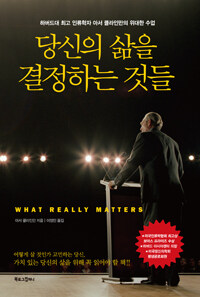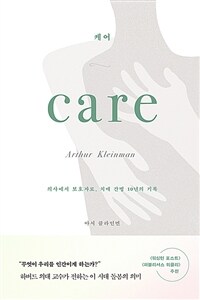
단행본
케어: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
- 서명/저자사항
- 케어: 의사에서 보호자로, 치매 간병 10년의 기록 / 아서 클라인먼 ; 노지양 옮김
- 개인저자
- Kleinman, Arthur | 노지양
- 발행사항
- 서울 : 시공사, 2020
- 형태사항
- 311 p. ; 22 cm
- ISBN
- 9788952776563
- 주기사항
-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EM05069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EM05069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의사와 보호자, 두 입장을 아우른 메디컬 인문학
동서양 학계와 의료 현장을 넘나들며 정신의학, 의료인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우뚝 선 아서 클라인먼을 기다리는 건 평화로운 노년이 아니었다. 연구 파트너이자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 조앤이 예순도 되지 않아 조발성(early-onset)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날, 부부는 그저 울었다. 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끝까지 집에서 아내를 돌볼 거라 약속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날 밤은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기나긴 간병의 시작이었다.
가족 보호자로서의 경험과 의료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담은 특별한 책이 《케어》다. 저자는 평생 의료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지만 환자의 가족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한다. 그가 병원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반복되는 각종 검사와 끝없는 대기, 병명과 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진료, 의료진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실질적 지원의 부재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의사와 몇 마디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의사에게 다음 단계에 대한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대부분은 답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잔인한 사이클임을 알면서도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적응하고 일상을 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본문에서)
장기 간병의 잔인한 현실과 구원의 순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며 이 병이 구분된 단계를 따르는 듯 설명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서의 표현처럼 “질병 서사는 절대 깔끔한 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병은 내리막길을 향해 인정사정없이 진행됐고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매일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어떻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아내를 돌볼 수 있었을까?
아서는 다른 가족 보호자가 그러하듯 ‘자신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다’는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노라 말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돌봄을 주는 사람 이상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모든 돌봄은 ‘상호성’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앤은 투병 마지막 몇 년을 제외하고는 돌봄의 적극적인 참여자였다.
조앤은 계속 흐트러졌다. 소변을 가리지 못해 성인용 기저귀를 차야 했다. 세 번 정도 대변을 참지 못해 바닥에 배변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난리 통에서 바닥을 닦으며 엉엉 울었다. 더 이상은 못한다는 걸 알아서였다. 조앤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당신 할 수 있어! 아서, 할 수 있어!” 그녀는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했다. 하고 또 했다. (본문에서)
요양원과 집,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조앤은 요양원에서 9개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아서가 조앤을 요양원에 맡기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오열한다. 의학적으로는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저자는 당시 자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가정 간병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유일한 선택지로만 생각했다. 마지막 해 혹은 18개월은 나에게나 조앤에게나 지옥이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본문에서)
초기부터 요양원을 대안으로 고민하는 게 답이었을까?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경험이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모든 간병 상황에 통하는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간병 경험을 제3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존엄하게 늙고 아플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의대의 교수이자 그 대학병원의 의사이기도 한 저자가, 일찌감치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정 간병에 매달리며 오랜 시간 홀로 분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돌봄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의료 현장에 누구보다 크게 좌절한 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개인에게 돌봄을 떠맡기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시기만 다를 뿐 늙음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고백하듯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일은 곧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아서 클라인먼의 역작 《케어》는 오늘날 사라져 가는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동서양 학계와 의료 현장을 넘나들며 정신의학, 의료인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우뚝 선 아서 클라인먼을 기다리는 건 평화로운 노년이 아니었다. 연구 파트너이자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 조앤이 예순도 되지 않아 조발성(early-onset)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날, 부부는 그저 울었다. 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끝까지 집에서 아내를 돌볼 거라 약속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날 밤은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기나긴 간병의 시작이었다.
가족 보호자로서의 경험과 의료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담은 특별한 책이 《케어》다. 저자는 평생 의료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지만 환자의 가족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한다. 그가 병원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반복되는 각종 검사와 끝없는 대기, 병명과 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진료, 의료진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실질적 지원의 부재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의사와 몇 마디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의사에게 다음 단계에 대한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대부분은 답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 잔인한 사이클임을 알면서도 여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적응하고 일상을 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본문에서)
장기 간병의 잔인한 현실과 구원의 순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며 이 병이 구분된 단계를 따르는 듯 설명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서의 표현처럼 “질병 서사는 절대 깔끔한 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병은 내리막길을 향해 인정사정없이 진행됐고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매일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어떻게 10년이란 세월 동안 아내를 돌볼 수 있었을까?
아서는 다른 가족 보호자가 그러하듯 ‘자신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다’는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노라 말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돌봄을 주는 사람 이상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모든 돌봄은 ‘상호성’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앤은 투병 마지막 몇 년을 제외하고는 돌봄의 적극적인 참여자였다.
조앤은 계속 흐트러졌다. 소변을 가리지 못해 성인용 기저귀를 차야 했다. 세 번 정도 대변을 참지 못해 바닥에 배변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난리 통에서 바닥을 닦으며 엉엉 울었다. 더 이상은 못한다는 걸 알아서였다. 조앤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당신 할 수 있어! 아서, 할 수 있어!” 그녀는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했다. 하고 또 했다. (본문에서)
요양원과 집,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조앤은 요양원에서 9개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아서가 조앤을 요양원에 맡기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날,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오열한다. 의학적으로는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저자는 당시 자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
나는 가정 간병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유일한 선택지로만 생각했다. 마지막 해 혹은 18개월은 나에게나 조앤에게나 지옥이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본문에서)
초기부터 요양원을 대안으로 고민하는 게 답이었을까?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경험이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모든 간병 상황에 통하는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간병 경험을 제3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존엄하게 늙고 아플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의대의 교수이자 그 대학병원의 의사이기도 한 저자가, 일찌감치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정 간병에 매달리며 오랜 시간 홀로 분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돌봄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의료 현장에 누구보다 크게 좌절한 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개인에게 돌봄을 떠맡기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시기만 다를 뿐 늙음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고백하듯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일은 곧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아서 클라인먼의 역작 《케어》는 오늘날 사라져 가는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
한국의 독자들에게
프롤로그
1장~11장
에필로그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