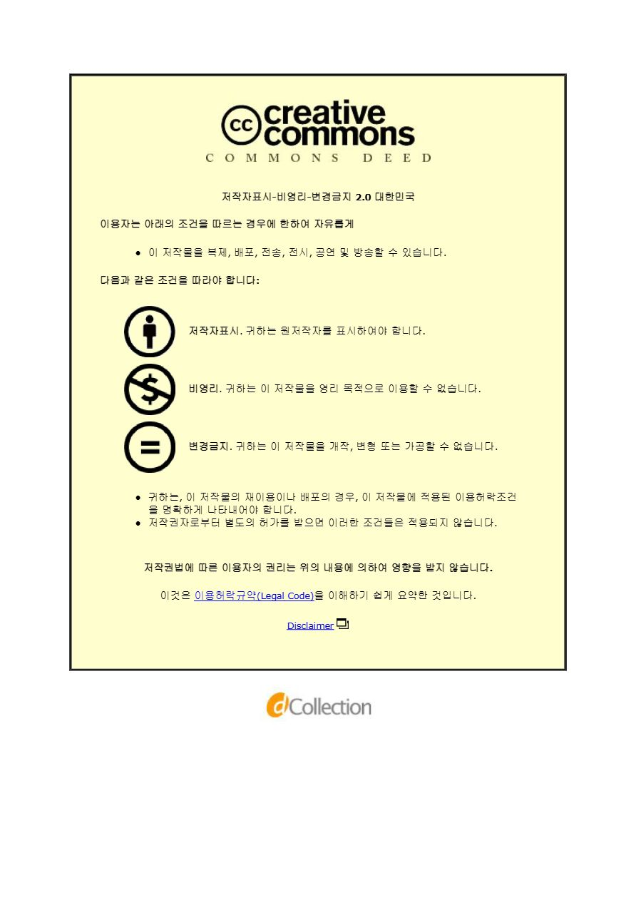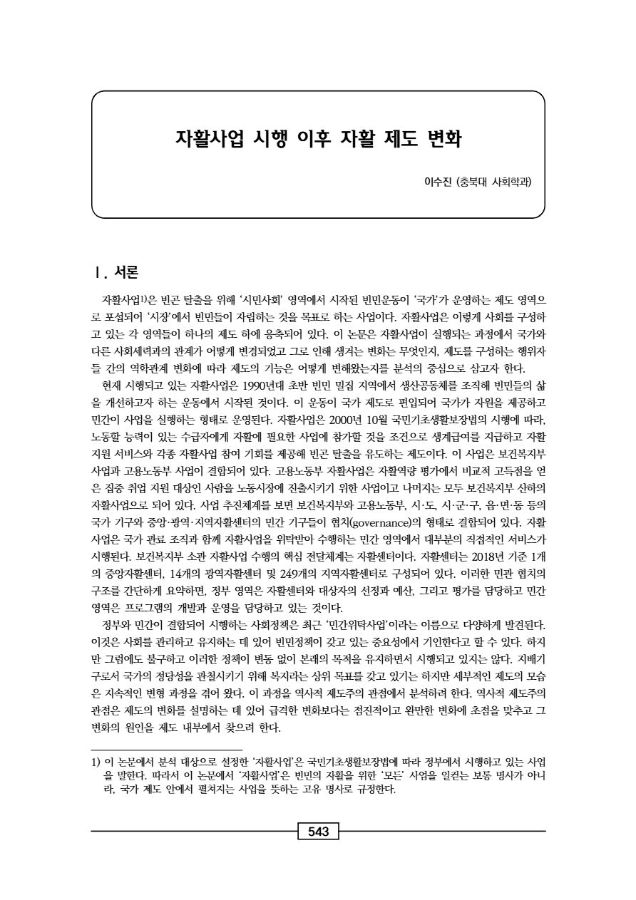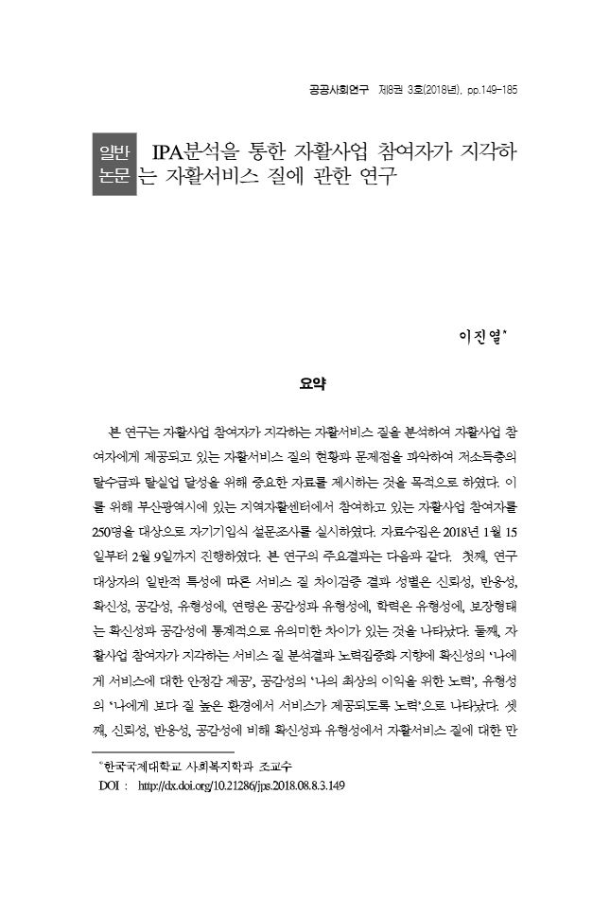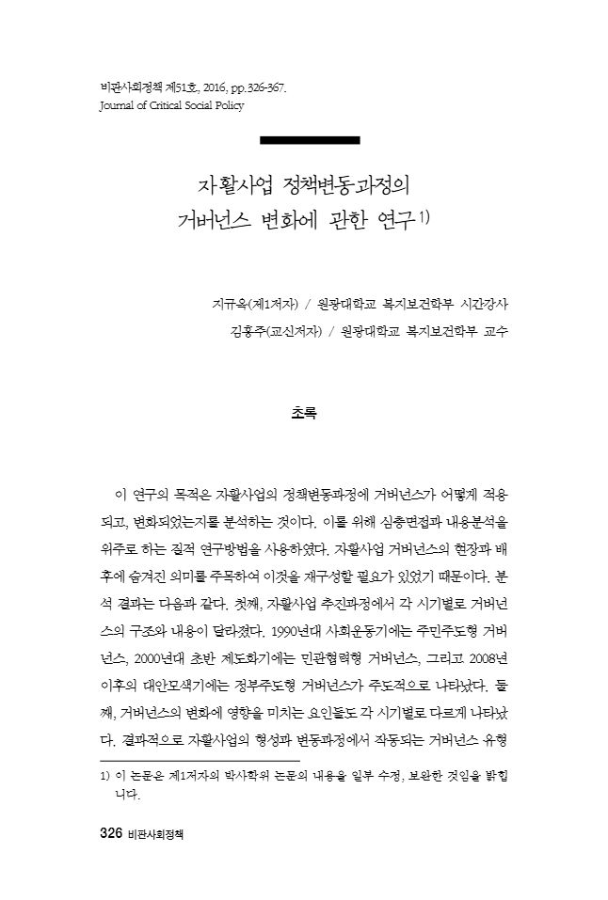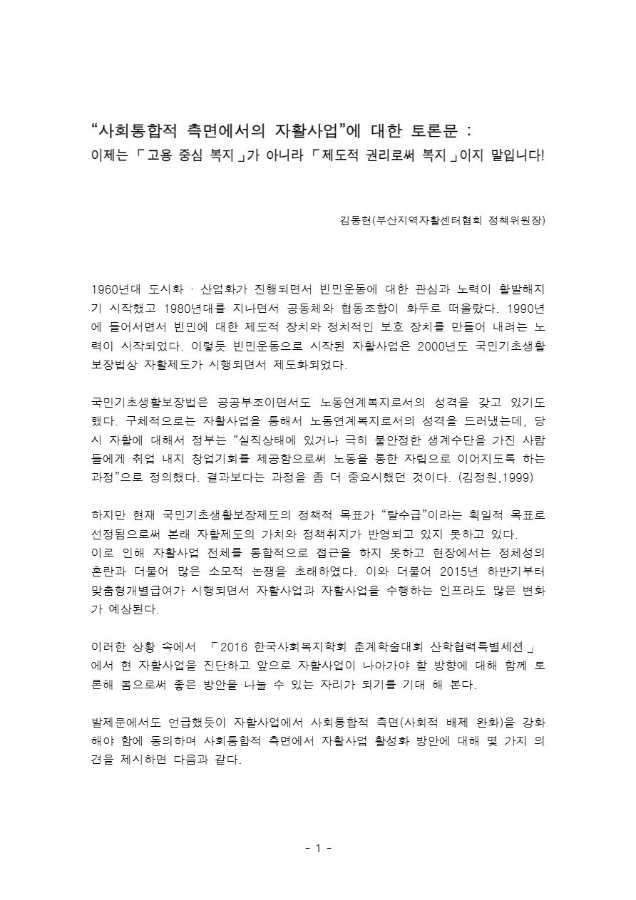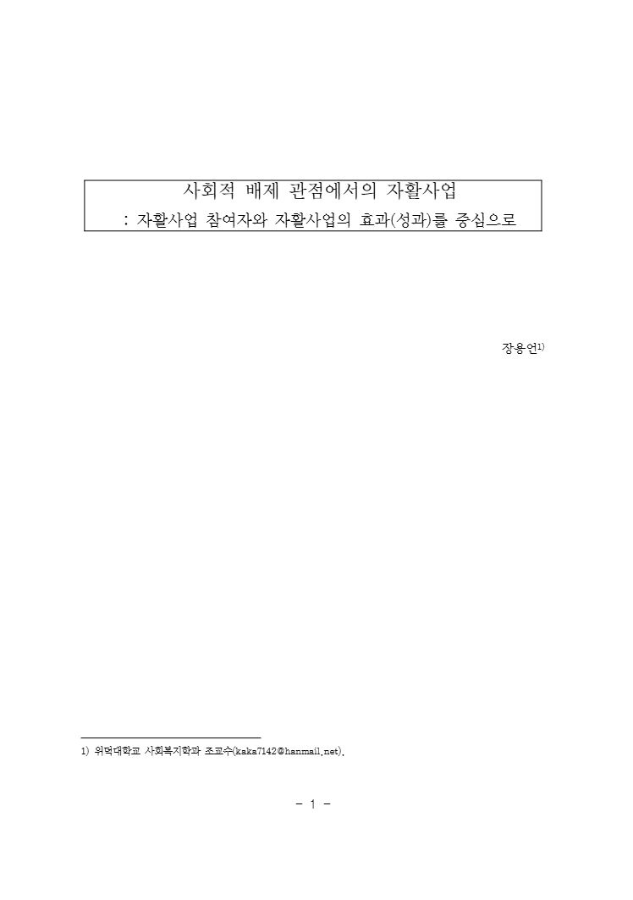정기간행물
자활사업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카테고리
- 일반
- 제공처
- 고려대학교 도서관
- 부제목
-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 다른언어제목
- A Study on the Formation acd Change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In Terms of Social Publicness
- 키워드
- 자활사업 , 제도화 , 공공성 , 사회운동형 공공성 , 시장연계형 공공성 , 시장친화형 공공성
- 저자
- 이수진
- 출판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발행연도
- 2017.
- 페이지
- 1-287
- URL
- 활용동의
- 미동의
요약
이 논문은 자활사업이 구성된 역사적 동학을 밝히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제도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공공성의 구조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변동에 따른 공공성의 구조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조직 구조와 절차, 규범, 협약, 행위와 같은 공적 요소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된다. 자활사업은 빈곤 탈출을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작된 빈민운동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영역으로 포섭되어 시장에서 빈민들이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논문은 빈민운동이 국가 영역으로 제도화된 것이 주체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과 정책 실행 단계에서 어떤 역관계가 작동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변화된 역학관계에 따라 제도의 목표와 기능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분석했다. 논문의 시기 구분은 시장화의 경향성에 따라 분류했다. 첫째, 형성기는 빈민운동 시기와 시범 자활사업이 시행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둘째, 성장기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셋째, 전환기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생산공동체 운동은 빈민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빈민의 삶의 양식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열악한 재정과 전문 경영 능력의 부족, 전문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파산했다. 생산공동체를 이끌던 빈민운동의 리더들은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대표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그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들은 정치참여와 협상 전략을 통해 정부와 연구 집단 등과 네트워크를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는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자활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자원의 안정화, 조직 목적의 온건화, 내부지향적 행위양식의 관례화였다. 이것은 사회운동이 제도화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유연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장기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확대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국가 복지의 확대로 나타났고 자활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공식 국가 제도로 시행되었다. 국가 제도로 시행된 자활사업의 변동은 참여자와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해 분석했다. 성장기에는 노동연계복지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노동을 유도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강조했다. 전달체계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했다. 전환기에는 취업과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취업 위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자활센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강화했고 관리통제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해석했다. 성장기에는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활의 목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 자활을 중시하는 것이 겹쳐지면서 제도가 변동해 왔다. 새로 생겨난 규칙이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양상을 통해 이 시기 제도 변화를 중첩으로 해석했다. 전환기에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변동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성을 시장 진출로만 평가하려 한 보수정부의 자활정책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것을 제도의 전환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각 시기의 공공성을 분석했다. 형성기에 자활사업은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고 의사소통 채널이 개방되어 있었다. 생산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적으로 구현하려 했다. 사회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의 공공성을 사회운동형 공공성으로 파악했다. 성장기에는 노동연계복지 지향성이 강했다. 제도는 국가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초기의 자발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정부 우위의 정책 결정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활사업은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호혜성과 재분배의 원칙보다 노동을 도구로 교환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장적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 시기의 공공성을 시장연계형 공공성으로 분석했다. 전환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 보수정부는 민주적 협약관계를 폐기하고 네트워크를 폐쇄했다. 성과관리 강화로 수직적 위계관계를 공고화했고, 시장친화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취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행했고 성과평가를 관행으로 굳혔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사회적 성격이 약해지면서 경제적 자활을 우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환기의 자활사업 공공성을 시장친화형 공공성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