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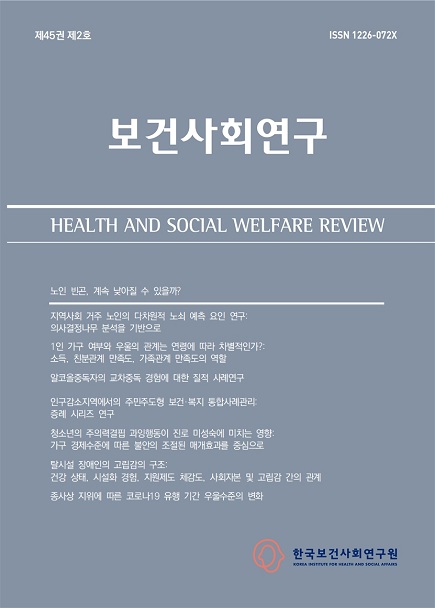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잠재 성장 모델 분석
Ag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among the Elderly: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Lee, Hyunsook Zin*; Yom, Young Hee
보건사회연구, Vol.37, No.2, pp.287-324, June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287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
초록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
Ⅰ.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 노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 10명당 1명(12.7%) 정도이나 2040년에는 3명당 1명(32.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0a; 통계청, 2010b).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외래 및 입원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중 11.4%를 차지하나 의료비 지출은 31.6%를 차지하여 노인의 의료이용은 노인인구 비율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도세록, 신은숙, 2012).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입원서비스 이용은 75% 이상이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입원서비스 이용률은 65-69세 노인은 24.9%, 70-74세 노인은 28.2%, 75세 이상은 31.0%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입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입원서비스 이용일수도 65세 미만에 비해 약 50%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 서비스 이용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외래서비스의 31.0%로 나타나 전체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30%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은 65세 미만 인구보다 입원서비스 이용의 경우 약 26.4%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노년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같은 노년기에 속해 있어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징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Laslett, 1991; Neugarten & Neugarten, 1996). 노년기 내에서의 다양성은 노년기의 초반의 초기노인(young-old)과 노년기 후반의 후기노인(old-old)의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심리적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년기 초반보다는 후반에 급격하게 나빠져(정영해, 조유향, 2014) 노년기 후반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노년기 후반에는 초반보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게 한다는 보고도 있다(이미진, 2009). 이는 고령일수록 건강악화를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에,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의료인에게 적게 이야기 하는 것(Deeg, Kardaun & Fozard, 1996; Sarkisian, Hays & Mangione, 2002)으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하듯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과 노년기의 질병 및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건강상태의 변화는 노년기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시기별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성과 패턴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노인인구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예측요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전해숙, 강상경, 2012).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횡단자료 분석에 대한 것이 많았고(송태민, 2013; 전해숙, 강상경, 2012; 황연희, 2011), 종단자료라 하더라도 연도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거나 각 연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이미진, 2009; 전해숙, 강상경, 2011). 횡단연구만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나 감소가 어떠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 개입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을 추정하고 연령대별로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상태의 변화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
의료이용행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어 온 모형인 앤더슨의 모형(Andersen, 1968)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행동”으로 보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앤더슨 모형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같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자원요인(enabling factors) 그리고 질병이나 통증과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요요인(needs factors)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Andersen & Newman, 1973; Andersen, Davidson & Ganz, 1994; Andersen, 1995). 앤더슨 모형이 의료이용을 살피는 모형으로 자주 이용되는 이유는 개인체계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요인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통합적 모형이기 때문이다(Wolinsky & Johnson, 1991).
선행요인은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개인 및 가족특성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갑자기 쉽게 수정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말한다. 즉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인종, 직업,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 그리고 의료 및 질병 등에 관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 등이 이에 속한다(Andersen & Newman, 1973).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성별은 일관성 있게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여성은 외래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남성은 입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진, 2009; 전해숙, 강상경, 2011; Liu, 2014). 이는 남성노인들은 심혈관계 및 호흡기 등의 질환을 주로 앓고 있는데 비해 여성노인은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이는 만성적으로 통증을 유발함으로 남성보다 좀 더 외래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Liu, 2014).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은 증가하나 연령의 증가와 의료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강상경, 2010; 이미진, 2009). 75세 미만의 초기노인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75세 이후 후기 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도세록, 신은숙, 2012; 이미진, 2009). 이는 초기노인의 경우 후기노인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많고, 신체기능이나 활동장애가 덜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이 유리한 반면(이미진, 2009), 후기노인은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약할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입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우경숙, 서제희, 김계수, 신영전, 2012).
앤더슨 모형의 가능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소득, 해당국가의 의료보장체계, 거주지역 등이 포함된다. 소득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가의 의료보장정책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의료보장정책이 잘 성립된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적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의료보장정책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다(손경복, 신자운, 임은옥, 이태진, 김홍수, 2015). 의료보장정책은 장애나 빈곤 등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다수 있다(임미영, 유호신, 2011). 반면,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고 입원할 확률이나 입원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외래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흥수, 2011).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지지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장애나 신체활동 제한과 같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진, 2009; Andersen, Davidson & Ganz, 1994).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동기능이나 신체활동 제한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다(전해숙, 강상경, 2013).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사회적 관계가 많은 노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이미진, 2009; 전해숙, 강상경, 2013). 거주지역은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도시지역은 농어촌 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서 의료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외래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보고들이 있다(이미진, 2009).
앤더슨 모형의 필요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요인들로써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장애, 질병, 통증 등을 포함한다(Andersen, Davidson & Ganz, 1994; Andersen, 1995). 특히 노년기에 증가하는 신체질환이나 기능저하는 노인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며(Linden, Horgas, Gilberg & Steinhagen-Thiessen, 1997),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생리적 신체적 노화를 촉진하여 입원 및 사망률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노년층에 있어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Schneider, Driesch, Kruse, Wachter, Nehen & Heuft, 2004).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입원서비스 및 외래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고, 특히 노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었다(우경숙, 서제희, 김계수, 신영전, 2012;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흥수, 2011). 만성질환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강상경, 2010; 송태민, 2013; 이미진, 2009; 전해숙, 강상경, 2012)으로 노인들의 입원서비스 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우경숙, 서제희, 김계수, 신영전, 2012; 이미진, 2009;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흥수, 2011) 통증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전해숙, 강상경, 2012).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고(Wolff, Starfield & Andersen, 2002),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나 활동장애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증장애일 경우 외래서비스 이용이 많고, 간장애나 호흡기 장애 등 중증장애인 경우, 입원서비스 이용이 많았다(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흥수, 2011).
2. 의료비 지출의 예측요인
노인 의료비의 결정요인에서 주요 쟁점은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법과 제도의 영향 그리고 건강상태의 변화이다(손경복, 신자운, 임은옥, 이태진, 김홍수, 2015).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국내총생산과 같은 거시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Fogel, 1999), 개인단위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1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altagi & Moscone, 2010). 반면, 개인차원의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보험의 영향을 받는데, 보험이 존재하면 개인의 한계 의료비 지출은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본다(Przywara, 2010). 각 나라의 법과 제도도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로는 보험정책, 건강보장제도의 재정, 보건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 보험자 및 보건의료제공자 사이의 경쟁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재원의 공적비중이 큰 경우 1인당 보건의료지출이 감소하고, 지불보상제도에서 행위별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한다(Gerdtham, Søgaard, Andersson, & Jonsson, 1992).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의료비는 증가하지만(정완교, 2012), 단순히 연령의 증가와 의료비 지출 증가 관련보다는 의료비 지출은 “사망에 이르는 시간” 즉 사망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망 시 연령이 많은 노인이 의료비 지출은 적었다(석상훈, 2012; 정완교, 2012). 그리고 노인 단독가구보다는 부부가구가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윤정혜, 김시월, 장윤희, 조향숙, 송현주, 2010), 이는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지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 만성질환 및 질환여부, 장애여부, 의료보장, 가족 구성원과 사회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석상훈, 2012; 윤정혜, 김시월, 장윤희, 조향숙, 송현주, 2010).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김양례, 2006) 노인일자리 참여와(배지영, 2012) 같은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는 노인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노년기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관련 연령차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확장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전해숙, 강상경, 2012; Cavanaugh & Kail, 2007). 60대 노인과 80대 노인은 신체, 심리, 사회적 특징으로 동일집단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양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이러한 노년기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여 노년학자들은 노년기를 두 단계 내지는 세 단계로 세분하여 접근하고 있다(Laslett, 1991; Neugarten, 1974). Neugarten(1974)은 노인집단을 74세 미만의 초기노인(young-old)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old-old)으로 구분하여 초기노인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여 자주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후기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의존성이 증가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후기노인들이 초기노인들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후기노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의료접근성 측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신체활동에 제한이 많으므로 초기노인이 오히려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다(강상경, 2010; 이미진, 2009). 외래서비스의 경우, 초기노인은 연령이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후기노인은 연령이 많을수록 외래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다. 반면 입원서비스 이용은 후기노인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전해숙, 강상경, 2012). 자원요인 중에서는 후기노인은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경우,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기노인은 차이가 없었다. 욕구요인 중에서는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에게 외래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초기노인에게 더 많았다(전해숙, 강상경, 2012).
4. 기존연구의 한계 및 연구 질문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장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의료비 지출과 건강성과의 발달궤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대부분 횡단자료 연구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일부 의료서비스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노인의 외래서비스 이용 단일요인에 대한 연구였고(강상경, 2010; 전해숙, 강상경, 2013),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 셋째, 수명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층 사이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 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과 이들 변수들의 발달궤적 관계에 있어서 연령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과 이들 발달궤적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의 초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을 구분하여 이들 변인들의 발달궤적의 상호관계와 예측요인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입영역이나 방법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에 기반을 두고 한국의료패널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형성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건부 모형 추정과 연령별 차이에 대한 분석이 주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자료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자료는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 전국 7,866가구 24,616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전국 대표 샘플인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앤더슨 모형의 주요변수들인 외래,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및 개인의료비와 가구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주요 예측요인들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및 욕구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를 위한 적합한 자료이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에는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 활동상태 등 일상생활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속 유지된 가구원 14,143명 중 2009년 조사 당시 65세 이상 노인 2,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내생변수인 의료서비스 이용은 입원서비스 이용 중 입원일수를 사용하였다. 입원이용일수는 전년도 측정시점부터 당해 연도 측정시점 사이에 사용한 총 입원이용일수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입원이용일수 분포가 정상분포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분석에서는 자연로그변환 값을 사용하였다.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급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지출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인 직접의료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와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포함한다. 의료비 지출도 입원이용일수와 마찬가지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아 분석을 위하여 자연로그변환 값을 취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3차 조시시점인 2010년부터 부가조사에서 포함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 1점, “좋음” 2점, “보통” 3점, “나쁨” 4점, “매우 나쁨”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외생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하는 선행요인, 자원요인, 그리고 위험요인인 필요요인을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계층인식,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인식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인 경우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이상 6을 사용하였다. 계층인식은 5년 동안 주관적 계층인식을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혼인상태는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1, 한번이라도 이혼, 별거, 사별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자원요인은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 그리고 의료보장형태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경제활동여부는 5년간 지속적으로 경재활동에 참여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소득은 가구원 1인당 소득의 5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 가입자 0, 의료급여 수급자는 1로 코딩하였다. 필요요인으로는 장애 여부, 만성질환, 그리고 통증 및 불편감을 사용하였다. 장애여부는 2009년 조사시점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없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만성질환 수, 통증이나 불편감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1, 다소 있다고 응답한 경우 2,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경우 3으로 코딩하였다. 만성질환 수와 통증, 불편감은 조사기간 5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표본을 통한 전국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통계는 SPSS 21.0을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분석은 AMOS 21.0을 이용하였다. 연구질문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은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개인 내에서의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변화모형추정은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고, 모형적합도는 카이지수(χ2)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절대적합지수와 CFI(comparative fix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인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하여 RMSEA가 .09미만, CFI와 TLI가 .90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연구 질문인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과 선행요인, 자원요인, 및 필요요인이 이들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 전체 | 초기노인 | 후기노인 | χ2/ t, F | p | ||||||||
|---|---|---|---|---|---|---|---|---|---|---|---|---|---|
|
|
|
|
|||||||||||
| n | % | M±SD | n | % | M±SD | n | % | M±SD | |||||
|
|
|||||||||||||
| 선 행 요 인 | 성별 | 남 | 953 | 42.0 | 741 | 44.0 | 212 | 36.3 | 10.62 | .001 | |||
| 여 | 1,314 | 58.0 | 942 | 56.0 | 372 | 63.7 | |||||||
|
|
|||||||||||||
| 연령 | 2,267 | 71.62±5.22 | 1,683 | 69.14±2.76 | 584 | 78.78±3.87 | 65.09 | <.001 | |||||
|
|
|||||||||||||
| 연령 그룹 | 65-69세 | 946 | 41.7 | 946 | 56.2 | ||||||||
| 70-74세 | 737 | 32.5 | 737 | 43.8 | |||||||||
| 75-79세 | 397 | 17.5 | 397 | 68.0 | |||||||||
| 80세이상 | 187 | 8.3 | 187 | 32.0 | |||||||||
|
|
|||||||||||||
| 혼인 상태 | 혼인 중 | 1,419 | 62.6 | 1,170 | 69.5 | 249 | 42.6 | 133.81 | <.001 | ||||
| 별거, 이혼, 사별 | 848 | 37.4 | 513 | 30.5 | 335 | 57.4 | |||||||
|
|
|||||||||||||
| 교육 수준 | 무학 | 426 | 18.8 | 237 | 14.1 | 189 | 32.4 | 111.58 | <.001 | ||||
| 초등학교졸업 | 1,007 | 44.4 | 758 | 45.0 | 249 | 42.6 | |||||||
| 중학교졸업 | 340 | 15.0 | 291 | 17.3 | 49 | 8.4 | |||||||
| 고등학교졸업 | 342 | 15.1 | 280 | 16.6 | 62 | 10.6 | |||||||
| 대학교졸업 이상 | 152 | 6.7 | 117 | 6.9 | 35 | 6.0 | |||||||
|
|
|||||||||||||
| 자 원 요 인 | 의료 보장 | 건강보험 | 2,032 | 91.7 | 1,535 | 92.8 | 497 | 88.6 | 9.81 | .002 | |||
| 의료급여 | 183 | 8.3 | 119 | 7.2 | 64 | 11.4 | |||||||
|
|
|||||||||||||
| 경제 활동 | 경제활동 하고 있음 | 749 | 33.0 | 657 | 39.0 | 92 | 15.8 | 106.25 | <.001 | ||||
| 경제활동 하지 않음 | 1,518 | 67.0 | 1,029 | 61.0 | 492 | 84.2 | |||||||
|
|
|||||||||||||
| 소득수준 (만원) | 2,213 | 861±578 | 1,653 | 875±559 | 560 | 822.±631 | -1.87 | .061 | |||||
|
|
|||||||||||||
| 필 요 요 인 | 장애 유무 | 장애 없음 | 1,917 | 86.5 | 1,436 | 86.8 | 481 | 85.7 | .42 | .517 | |||
| 장애 있음 | 298 | 13.5 | 218 | 13.2 | 80 | 14.3 | |||||||
|
|
|||||||||||||
| 통증/ 불편 감 | 통증/불편 없음 | 921 | 43.7 | 733 | 46.0 | 188 | 36.2 | 15.35 | <.001 | ||||
| 통증/불편 다소있음 | 1,107 | 52.4 | 799 | 50.2 | 308 | 59.3 | |||||||
| 통증/불편 매우심함 | 83 | 3.9 | 60 | 3.8 | 23 | 4.4 | |||||||
|
|
|||||||||||||
| 통증/불편감 | 2,111 | 1.60±0.56 | 1,592 | 1.58±0.57 | 519 | 1.68±0.55 | 3.69 | <.001 | |||||
|
|
|||||||||||||
| 만성질환 (수) | 1,903 | 4.08±2.12 | 1,406 | 4.03±2.11 | 497 | 4.24±2.14 | 1.87 | .062 | |||||
|
|
|||||||||||||
| 계층 인식 | 상 | 737 | 43.8 | 237 | 40.6 | 1.82 | .177 | ||||||
| 하 | 946 | 56.2 | 347 | 59.4 | |||||||||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총 2,267명으로, 남성이 953명으로 42.0%이고, 여성은 1,314명으로 58.0%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71.6세였으며, 65-74세의 초기노인은 1,683명으로 74.2%를 차지하였고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584명으로 25.8%였다. 연구대상자 중 혼인 중으로 조사된 경우는 1,419명으로 62.6%를 차지하였고 조사기간 중 한번이라도 별거 경험이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는 848명으로 37.4%를 차지하였다.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426명으로 18.8%를 차지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1,007명으로 44.4%를 차지하였다. 중학교 졸업자는 340명 15.0%, 고등학교 졸업자는 342명, 15.1%를 차지하였고,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은 152명으로 6.7%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계층이 낮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293명으로 57.0%였고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74명으로 43.0%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91.7%인 2,032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183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749명으로 33.0%를 차지하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1,518명으로 67.0%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 소득은 861만원으로 나타났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98명 13.5%였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통증이나 불편감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21명, 43.7%였으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190명으로 52.4%였다. 3점 척도로 측정된 통증 또는 불편감의 평균은 1.6,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수는 4.08개 이었다. 초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비해 남성이 더 많고(χ2=10.62, p=.001), 혼인 중인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χ2=133.81, p=<.001), 교육수준도 더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와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후기노인은 초기노인에 비해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더 많았고(χ2=15.32, p<.001), 만성질환 수도 더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분석결과
가.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인의 변화모형을 설정하고,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표 2).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초기값의 평균은 0.960(p<.001), 변량은 0.102(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입원이용일수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있었다. 입원이용일수 초기값은 평균 16.29일이었고 매년 12.86일씩 증가하였다.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평균은 0.063으로 측정기간 동안 입원이용일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변화율의 변량이 0.377(p<.001)로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무조건부 모형
| 평균 | 표준 오차 | 변량 | 표준 오차 | 모형적합도 | ||||||
|---|---|---|---|---|---|---|---|---|---|---|
| χ2 | TLI | CFI | RMSEA | |||||||
| 입원 이용 일수 | 초기값 (Intercept) | 로그변환 전 | 16.29 | .021 | 0.102*** | .028 | 17.135 | .913 | .940 | .018 |
| 로그변환 후 | 0.960*** | |||||||||
| 변화율 (Slope) | 로그변환 전 | 12.86 | .034 | 0.377*** | .074 | |||||
| 로그변환 후 | 0.063 | |||||||||
| 의료비 지출 | 초기값 (Intercept) | 로그변환 전 | 701.465 | .013 | 0.209*** | .012 | 219.856 | .869 | .912 | .096 |
| 로그변환 후 | 5.438*** | |||||||||
| 변화율 (Slope) | 로그변환 전 | 276.582 | .004 | 0.010*** | .001 | |||||
| 로그변환 후 | 0.050*** | |||||||||
| 주관적 건강 상태 | 초기값 (Intercept) | 2.873*** | .019 | 0.448*** | .026 | 25.324 | .977 | .989 | .042 | |
| 변화율 (Slope) | 0.072*** | .007 | 0.034*** | .005 | ||||||
의료비 지출의 초기값의 평균은 5.438(p<.001), 변량은 0.209(p<.001)로, 측정시점 1(2009년)에서 의료비 지출 정도가 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시점 1에서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은 701,465원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276,582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변화율의 평균은 0.050(p<.001), 변량은 0.010(p<.001)로 5년간 의료비 지출의 변화정도가 개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초기값 평균은 2.873(p<.001), 변량은 0.448(p<.001)로 측정시점 2인 2010년에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는 개인 간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0.072(p<.001), 변량은 0.034(p=.001)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도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을 정리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간의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성과의 발달궤적간 상호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이용일수 발달궤적, 의료비 지출 발달궤적,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그림 2). 각 변인의 초기값 간의 관계에서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의 초기값에는 정(+)적 관계(r=.068, p<.001)로 입원이용일수가 많을수록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지출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도 정(+)적 관계로(r=.104, p<.001)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아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용일수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에는 부(-)적 관계로 (β=-.680, p<.001),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의 증가가 느리고, 초기값이 적은 노인은 증가가 빨랐다.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의료비 지출 변화율도 부(-)적 관계 (β=-.480, p=.031)로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는 느리고, 입원이용일수가 적은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율 간에는 부(-)적 관계를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의료비 지출 초기값과 각 변인의 변화율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과 각 변인의 변화율간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율 간에는 부(-)적 관계(β=-.441, p<.001)로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가 느리게 나타나고, 점수가 낮은 노인은 점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간에는 정(+)적 관계(β=.245, p<.001)로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즉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건 다변량잠재성장모형분석: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번째 연구문제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성과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앤더슨 모형의 예측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표 3). 모형의 적합도는 χ2값이 670.957(df=174, p<.001)이었고 TLI값 .900, CFI값 .950, RMSEA값은 .036으로 대부분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3
조건 다변량잠재성장모형: 예측요인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 ||||||||
|
|
|
||||||||
| Estimate | S.E. | C.R. | p | Estimate | S.E. | C.R. | p | ||
|
|
|||||||||
| 선행 요인 | 성별 | -.046 | .051 | -.566 | .571 | -.058 | .013 | -1.376 | .169 |
| 연령 | .061 | .004 | .878 | .380 | .098 | .001 | 2.608 | .009 | |
| 혼인상태 | .236 | .051 | 3.005 | .003 | -.061 | .016 | -1.257 | .209 | |
| 교육수준 | -.126 | .021 | -1.555 | .120 | -.086 | .006 | -1.737 | .082 | |
| 계층인식 | -.089 | .020 | -1.136 | .256 | -.154 | .006 | -3.156 | .002 | |
|
|
|||||||||
| 자원 요인 | 의료보장 | .010 | .081 | .146 | .884 | .164 | .063 | 1.703 | .089 |
| 경제활동 | -.026 | .046 | -.373 | .709 | .034 | .015 | .864 | .388 | |
| 소득수준 | .088 | 0 | 1.188 | .235 | .046 | 0 | 1.131 | .258 | |
|
|
|||||||||
| 필요 요인 | 장애여부 | -.001 | .061 | -.015 | .988 | -.009 | .015 | -.177 | .859 |
| 통증/불편감 | .160 | .041 | 2.163 | .031 | .003 | .011 | .071 | .943 | |
| 만성질환 | .070 | .011 | .953 | .341 | -.083 | .006 | -.919 | .358 | |
|
|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751 | .081 | -4.572 | <.001 |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119 | .059 | .683 | .495 |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176 | .017 | 2.41 | .016 | |||||
|
|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의료비 지출 변화율 | ||||||||
|
|
|
||||||||
| Estimate | S.E. | C.R. | p | Estimate | S.E. | C.R. | p | ||
|
|
|||||||||
| 선행 요인 | 성별 | -.007 | .029 | -.216 | .829 | -.091 | .012 | -1.511 | .131 |
| 연령 | -.007 | .002 | -.274 | .784 | -.095 | .001 | -1.737 | .082 | |
| 혼인상태 | .083 | .028 | 2.76 | .006 | .057 | .016 | .741 | .458 | |
| 교육수준 | .022 | .012 | .728 | .467 | -.146 | .007 | -1.87 | .061 | |
| 계층인식 | .031 | .011 | 1.047 | .295 | -.018 | .006 | -.236 | .814 | |
|
|
|||||||||
| 자원 요인 | 의료보장 | -.419 | .045 | -15.464 | <.001 | -.051 | .058 | -.324 | .746 |
| 경제활동 | -.082 | .026 | -3.071 | .002 | .008 | .012 | .151 | .880 | |
| 소득수준 | .142 | 0 | 5.01 | <.001 | -.012 | 0 | -.206 | .837 | |
|
|
|||||||||
| 필요 요인 | 장애여부 | .017 | .034 | .681 | .496 | -.012 | .021 | -.308 | .758 |
| 통증/불편감 | .153 | .023 | 5.469 | <.001 | -.045 | .01 | -.789 | .430 | |
| 만성질환 | .543 | .006 | 19.505 | <.001 | -.100 | .009 | -.942 | .346 | |
|
|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487 | .102 | -1.536 | .124 |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104 | .076 | -.298 | .765 |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041 | .016 | .392 | .695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율 | ||||||||
|
|
|
||||||||
| Estimate | S.E. | C.R. | p | Estimate | S.E. | C.R. | p | ||
|
|
|||||||||
| 선행 요인 | 성별 | .063 | .042 | 2.046 | .041 | -.003 | .016 | -.064 | .949 |
| 연령 | -.071 | .003 | -2.652 | .008 | .100 | .001 | 2.479 | .013 | |
| 혼인상태 | .111 | .042 | 3.699 | <.001 | .031 | .020 | .584 | .560 | |
| 교육수준 | -.140 | .018 | -4.541 | <.001 | -.068 | .008 | -1.264 | .206 | |
| 계층인식 | -.236 | .016 | -7.858 | <.001 | -.150 | .008 | -2.81 | .005 | |
|
|
|||||||||
| 자원 요인 | 의료보장 | .002 | .066 | .061 | .951 | -.015 | .047 | -.181 | .857 |
| 경제활동 | -.098 | .038 | -3.663 | <.001 | -.059 | .012 | -1.587 | .112 | |
| 소득수준 | -.028 | 0 | -.989 | .322 | -.056 | 0 | -1.286 | .199 | |
|
|
|||||||||
| 필요 요인 | 장애여부 | .173 | .050 | 6.771 | <.001 | .046 | .017 | 1.275 | .202 |
| 통증/불편감 | .219 | .033 | 7.866 | <.001 | .131 | .014 | 3.041 | .002 | |
| 만성질환 | .263 | .009 | 9.244 | <.001 | -.036 | .008 | -.211 | .833 | |
|
|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184 | .115 | -.916 | .360 |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356 | .081 | 1.731 | .084 |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604 | .025 | -6.385 | <.001 | |||||
입원이용일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요인은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인식, 필요요인은 통증/불편감으로 나타났으나 자원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입원이용일수의 초기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이 많을수록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혼인상태에 있는 노인이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어, 초기 높은 입원이용일수가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이 낮은 노인에 비해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였다(β=-.154, p=.002). 필요요인 중에서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에서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았으나(β=.160, p=.031),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측정기간 5년 동안 통증이나 불편감이 많은 노인이 입원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혼인상태, 자원요인은 의료보장, 경제활동여부와 소득수준이, 필요요인에서는 통증이나 불편감,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초기 의료비 지출은 배우자와 혼인 중인 노인이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노인보다(β=.083, p=.006) 더 많았다. 자원요인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β=.142, p<.001) 더 많았고, 건강보험 대상 노인(β=.419, p<.001),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이(β=-.082, p=.002)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측정기간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에서는 통증/불편감이 있는 노인과 만성질환이 초기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선행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계층인식이, 자원요인으로는 경제활동여부, 필요요인에는 장애여부, 통증/불편감 그리고 만성질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고(β=.063, p=.041), 연령이 많은 노인이 적은 노인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좋게 인식하였으나(β=-.009, p=.008),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이 많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0, p=.013). 교육수준이 높고(β=-.140, p<.001),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이(β=-.236, p<.001)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자신의 계층인식이 높은 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속도가 느리고, 계층인식이 낮은 노인은 그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β=-.150, p=.005).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평가하였고(β=-.098, p<.001), 장애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였다(β=.173, p<.001). 통증이나 불편감 점수가 높을수록(β=.219, p<.001) 만성질환이 많을수록(β=.263, p<.001)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감이 높은 노인은 자신의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진다고 인식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낮은 노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느리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1, p=.002).
라. 다중집단분석: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의 상호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번째 연구문제인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65-74세 초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 값 613.229(df=134, p<.001)이었고 TLI값 .872, CFI값 .927, RMSEA 값은 .040으로 대부분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먼저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4>, 초기노인에서는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적 관계(β=-.863, p<.001),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과 입원이용일수 변화율은 정(+)적 관계로(β=.186, p=.011),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과 변화율도 부(-)적 관계(β=-.566, p<.001)로 나타났다. 즉,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고, 입원이용일수가 적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상태도 빠르게 나빠졌다. 반면 초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 증가가 느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도 느리게 진행되었다. 반면 후기노인은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변화율은 정(+)적 관계로(β=1.418, p=.031),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의료비 지출 변화율은 부(-)적 관계로(β=-1.402, p=.002)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적은 노인은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였다. 의료비 지출은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적은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4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집단 간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간 관계
| 초기노인(65-74세) | 후기노인 (75세 이상) | |||||
|---|---|---|---|---|---|---|
|
|
|
|||||
| Estimate | C.R. | p | Estimate | C.R. | p | |
|
|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 -.863 | -3.315 | <.001 | 1.418 | 2.157 | .031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의료비 지출 변화율 | -.710 | -1.132 | .258 | -1.402 | -3.026 | .002 |
| 입원이용일수 초기값 →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율 | .004 | .015 | .988 | -.123 | -.158 | .874 |
|
|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 .254 | .889 | .374 | -1.317 | -1.194 | .232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의료비 지출 변화율 | .236 | .334 | .738 | .226 | .252 | .801 |
| 의료비 지출 초기값 →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율 | .143 | .564 | .573 | .169 | .301 | .763 |
|
|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입원이용일수 변화율 | .186 | 2.552 | .011 | 1.142 | 1.256 | .209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의료비 지출 변화율 | .074 | .571 | .568 | -.525 | -.727 | .467 |
|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 →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율 | -.566 | -7.331 | <.001 | .078 | .152 | .879 |
예측요인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에서(표 5) 성별과 연령은 두 집단의 입원이용일수에 차이를 보였다. 초기노인의 경우, 여성이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았으나, 후기노인은 남성이 더 많았다(△x2= 5.573, p=.018).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입원이용일수 증가가 더 빨랐으나, 후기노인의 여성이 초기노인의 여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x2= 4.110, p=.043). 두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후기노인집단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초기노인 집단에서 의료급여 대상 노인이 건강보험 노인보다 1차년도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았으나, 후기노인은 건강보험 노인이 의료급여 노인보다 많았다(△x2=11.267, p=.001).
표 5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 입원이용일수 | |||||||||
|
|
|||||||||
| 초기노인 | 후기노인 | 변화량 | |||||||
|
|
|
|
|||||||
| Estimate | C.R. | p | Estimate | C.R. | p | X2 | p | ||
|
|
|||||||||
| 선 행 요 인 | 성별 → 초기값 | .043 | .541 | .588 | -.595 | -2.22 | .026 | 5.573 | .018 |
| 성별 → 변화율 | .066 | 1.309 | .191 | .908 | 1.455 | .146 | 4.11 | .043 | |
| 연령 → 초기값 | .046 | 126.821 | <.001 | .152 | 62.807 | <.001 | 13.949 | <.000 | |
| 연령 → 변화율 | .006 | -.139 | .889 | .012 | -.221 | .825 | 4.823 | .028 | |
|
|
|||||||||
| 자 원 요 인 | 의료보장 → 초기값 | .096 | 1.210 | .226 | -.182 | -.665 | .506 | 11.267 | <.001 |
| 의료보장 → 변화율 | .095 | .616 | .538 | -.464 | -.655 | .513 | 1.469 | .225 | |
| 경제활동 → 초기값 | -.008 | -.102 | .919 | -.111 | -.402 | .688 | .617 | .432 | |
| 경제활동 → 변화율 | .059 | 1.286 | .198 | .364 | .743 | .457 | 1.932 | .165 | |
|
|
|||||||||
| 필 요 요 인 | 장애여부 → 초기값 | .052 | .665 | .506 | -.123 | -.457 | .648 | -.107 | 1.000 |
| 장애여부 → 변화율 | .091 | 2.046 | .041 | -.077 | -.146 | .884 | .665 | .415 | |
| 만성질환 → 초기값 | .048 | .576 | .565 | .478 | 1.649 | .099 | 2.822 | .093 | |
| 만성질환 → 변화율 | -.148 | -.871 | .384 | -.602 | -.912 | .362 | 2.021 | .155 | |
|
|
|||||||||
| 입원이용일수 | |||||||||
|
|
|||||||||
| 초기노인 | 후기노인 | 변화량 | |||||||
|
|
|
|
|||||||
| Estimate | C.R. | p | Estimate | C.R. | p | X2 | p | ||
|
|
|||||||||
| 선 행 요 인 | 성별 → 초기값 | -.052 | -1.694 | .090 | .046 | .967 | .334 | 2.966 | .085 |
| 성별 → 변화율 | .067 | .682 | .495 | -.880 | -1.791 | .073 | 5.913 | .015 | |
| 연령 → 초기값 | .026 | 185.202 | <.001 | .033 | 75.439 | <.001 | 1.441 | .230 | |
| 연령 → 변화율 | -.022 | .570 | .569 | -.044 | 1.229 | .219 | 12.736 | <.001 | |
|
|
|||||||||
| 자 원 요 인 | 의료보장 → 초기값 | -.436 | -14.192 | <.001 | -.473 | -9.701 | <.001 | 10.912 | .001 |
| 의료보장 → 변화율 | .116 | .311 | .755 | -.027 | -.047 | .962 | 7.922 | .005 | |
| 경제활동 → 초기값 | .055 | 1.808 | .071 | .071 | 1.454 | .146 | 10.91 | .001 | |
| 경제활동 → 변화율 | -.048 | -.559 | .576 | -.201 | -.502 | .615 | 3.147 | .076 | |
|
|
|||||||||
| 필 요 요 인 | 장애여부 → 초기값 | .044 | 1.44 | .150 | .004 | .090 | .928 | -.658 | 1.000 |
| 장애여부 → 변화율 | -.002 | -.026 | .979 | -.288 | -1.621 | .105 | -1.156 | 1.000 | |
| 만성질환 → 초기값 | .599 | 18.637 | <.001 | .519 | 10.078 | <.001 | 11.434 | .001 | |
| 만성질환 → 변화율 | -.345 | -.845 | .398 | .706 | 1.336 | .182 | 14.034 | .000 | |
|
|
|||||||||
| 입원이용일수 | |||||||||
|
|
|||||||||
| 초기노인 | 후기노인 | 변화량 | |||||||
|
|
|
|
|||||||
| Estimate | C.R. | p | Estimate | C.R. | p | X2 | p | ||
|
|
|||||||||
| 선 행 요 인 | 성별 → 초기값 | .163 | 5.334 | <.001 | .163 | 2.881 | .004 | 1.55 | .213 |
| 성별 → 변화율 | .080 | 1.821 | .069 | -.182 | -.397 | .692 | -1.408 | 1.000 | |
| 연령 → 초기값 | .020 | 143.769 | <.001 | .034 | 65.663 | <.001 | 4.79 | .029 | |
| 연령 → 변화율 | .022 | -.666 | .505 | .048 | -.716 | .474 | 10.218 | .001 | |
|
|
|||||||||
| 자 원 요 인 | 의료보장 → 초기값 | .086 | 2.802 | .005 | .125 | 2.155 | .031 | 1.956 | .162 |
| 의료보장 → 변화율 | .101 | .736 | .462 | .13 | .534 | .593 | -.995 | 1.000 | |
| 경제활동 → 초기값 | .002 | .081 | .935 | .052 | .888 | .374 | 1.816 | .178 | |
| 경제활동 → 변화율 | -.064 | -1.615 | .106 | -.078 | -.498 | .618 | 1.414 | .234 | |
|
|
|||||||||
| 필 요 요 인 | 장애여부 → 초기값 | .216 | 7.136 | <.001 | .282 | 4.963 | <.001 | 5.869 | .015 |
| 장애여부 → 변화율 | .035 | .905 | .365 | -.039 | -.091 | .928 | 9.183 | .002 | |
| 만성질환 → 초기값 | .280 | 8.517 | <.001 | .443 | 7.207 | <.001 | 5.096 | .024 | |
| 만성질환 → 변화율 | .035 | .235 | .814 | -.292 | -.983 | .326 | 2.808 | .094 | |
의료비 지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차이에서 선행요인은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쳤다. 초기노인에서는 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가 빨랐으나, 후기노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의료비 지출이 증가가 빨랐다. 두 집단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 증가가 느리게 나타났으나, 초기노인(β=-.022, ns)에서 후기노인(β=-.044, ns)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에서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의료급여 대상 노인의 1차년도 의료비 지출이 더 적었으나, 후기노인(β=-.473, p<.001)이 초기노인(β=-.436, p<.001)보다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하였다(△x2=10.912,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노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β=.116, ns), 후기노인(β=-.027, ns)은 건강보험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x2=7.922, p=.005).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초기노인(β=.055, ns)과 후기노인(β=,071, ns) 모두 1차년도 의료비 지출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후기노인이 초기노인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다(△x2=10.910, p<.001). 필요요인에서는 만성질환이 영향을 미쳤는데, 초기노인(β=.599, p<.001)이 후기노인(β=.519, p<.001)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434,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기노인(β=.706, ns)이 초기노인(β=-.345, ns)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x2=14.034, p<.001).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중에서 연령은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후기노인에서 더 컸다(△x2=4.79, p=.029). 즉, 후기노인(β=.034, p<.001)이 초기노인(β=.020, p<.001)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후기노인이 더 빠르게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x2=10.218, p=.001). 필요요인인 장애와 만성질환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는 두 노인 집단 모두 1차년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후기노인에서 그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x2=5.869, p=.0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더 빠르게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하였다(△x2=9.183, p=.002). 만성질환은 두 집단 모두에서 초기에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영향력은 후기노인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x2=5.096, p=.024). 시간이 지남에 따른 영향은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노화에 따른 급속한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로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노년기 연장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1).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같은 노년기에 속해 있어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징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aslett, 1991; Neugarten & Neugarten, 1996), 이는 노년기 초반과 후반의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행태와 이들 변수들의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 사이에서 건강수준의 다양성과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인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 이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지, 또 노인의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 및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1.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주제는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 양상과 각 요인들의 발달궤적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예측한대로 노인의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조사기간 5년 동안 선형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요인들 발달궤적의 상호관계에서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에서 초기(2009년)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이 적었던 노인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초기 외래 서비스 이용이 많은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강상경, 2010; 전해숙, 강상경, 2013)과 일치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개인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진다고 인식하였고, 반면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빠르게 나빠진다고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개인 간의 건강인식 격차가 줄어들었다. 입원 이용일수의 초기값과 의료비 지출의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느리고, 입원이용일수가 적은 노인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와 입원이용일수의 관계에서, 초기에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좋게 인식한 노인은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앤더슨 행동모형의 필요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입원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강상경, 2010; 이미진, 2009; 이현숙, 2016)를 지지하였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노인의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입원이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선행요인 중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인식이, 필요요인에서는 통증/불편감이 영향을 미치고 자원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요인 중에서 연령이 많은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이미진, 2009)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적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및 기능저하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우자와 혼인 중인 노인이 입원이용일수가 많았는데, 이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관계가 많은 노인일수록 입원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전해숙, 강상경, 2012).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이미진, 2009).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사전에 건강에 유의하여 입원서비스 이용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요인인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여부 및 소득수준은 입원이용일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보장형태와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입원이용일수에 차이가 없다는 횡단적 선행연구(손경복, 신자운, 임은옥, 이태진, 김홍수, 2015)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정책과 의료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시행되어 소득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요인에서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높을수록 초기 입원이용일수는 많았고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어 초기(2009년)의 입원이용일수의 차이가 조사기간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이용의 필요요인이 입원서비스 이용횟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Andersen et al., 1994; Andersen 1995; 전해숙, 강상경, 2012)와 유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선행요인에는 혼인상태, 자원요인에서는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이, 필요요인에서는 통증/불편감과 만성질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혼인 중인 노인이 초기 의료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어 초기 높은 의료비 지출이 5년간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 노인가구 보다는 부부 노인가구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윤정혜, 김시월, 장윤희, 조향숙, 송현주, 2010; 이미진, 2009)와 일치하였다. 배우자와 가족이 없는 경우 활동제한 및 정보부족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이미진, 2009) 적절히 의료이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요인에서 건강보험 대상 노인이 의료급여대상 노인보다 초기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한국의 의료급여시스템에서는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건강보험대상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석원, 임재영, 2007; 황연희, 2011)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적다(배지영, 2012)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선행연구(석상훈 2012; 정완교,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초기 높은 의료비 지출이 5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이 낮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비교적 잘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낮았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허락하는 한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통증/불편감과 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의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입원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진수, 2011)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의료비 지출증가에는 만성질환보다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은 입원이용일수를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통증이나 불편감은 입원이용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계층인식이, 자원요인에서는 경제활동여부, 그리고 필요요인에서는 장애여부, 통증/불편감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고 이 상태가 조사기간 5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기능적 구조와 사회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Kaur et al., 2007)와 일치한다.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고령일수록 건강악화를 자연스런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건강문제를 의료인에게 덜 이야기 한다는 선행연구(Sarkisian, Hays & Mangione, 2002)에 비추어 볼 때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악화를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은 노인이 초기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가 더 느리게 나빠진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소득이 높고 계층인식이 높은 경우, 치료적 의료서비스 보다는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전해숙, 강상경, 2011) 평소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배지영, 2014)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초기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와 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배지영, 2012; 이석원, 임재영, 2007; 황연희, 2011)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참여의 영향으로 건강상태악화가 느려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원요인인 의료보장형태와 소득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노인의 건강상태 인식에는 소득수준보다는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노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요요인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통증이나 불편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에는 장애나 만성질환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태 관리에 통증이나 불편감의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용하여 설정된 예측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 입원이용일수에는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이용일수의 변화율에는 정 적(+) 관계로 나타나는 요인이 의료비 지출 변화에는 부 적(-) 영향관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주제는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간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중집단분석결과 발달궤적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노인에서는 초기(2009년)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느리게 증가하여 개인 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기노인에서는 초기 입원이용일수가 많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개인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초기노인에서는 초기(2010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 악화가 빠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노인은 악화가 느려 점차 개인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또한 건강상태와 입원이용일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2010년)에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한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노인은 입원이용일수 증가가 느려, 주관적 건강상태가 입원이용일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기노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초기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와 입원이용일수에서 개인 간 차이가 줄어들어 평준화 현상이 발생하나, 후기노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전기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한 상태에서 노인후기에 접어들 경우, 노인전기 때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고, 입원이용일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노인의 경우 초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가 빠르게 악화된다고 인식하므로 노인전기 때의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하고 건강악화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요인에서 입원이용일수에 연령대별 집단 차이를 보인 요인은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초기노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입원이용일수에 차이가 없었으나, 후기노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고, 초기노인 여성보다 후기노인 여성의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후기노인의 남성이 여성보다 입원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전해숙, 강상경, 2012). 연령이 입원이용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있었는데, 초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에서 그 영향력이 더 컸다. 이는 노년기 전기보다 후기에 외래 서비스 이용이 줄어든다(강상경, 2010; 이미진, 2009)는 것과 다른 현상으로 입원서비스의 경우, 외래 서비스 보다 연령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장 유형의 영향은 초기노인에서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입원이용일수가 많았으나, 후기노인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가 더 많았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이미진, 2009)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초기노인의 경우 후기노인보다 신체적 기능이나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이 후기노인보다 덜 할 것으로 추측된다. 만성질환은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입원이용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영향력은 후기노인에서 더 컸다. 이는 노년기 후기로 갈수록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입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를 더 크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보인 요인은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여부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초기노인에서는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나, 후기노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두 집단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느리게 증가하였는데. 그 정도는 후기노인에서 더 느렸다. 이는 노년기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사망 즈음에 발생하는데, 사망 시 연령이 많은 노인이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한다는 선행연구(석상훈, 2012; 정완교, 201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대상자보다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기노인의 건강보험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 후기에 신체적 기능저하와 만성질환 등의 영향으로 입원이용일수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입원서비스 이용으로 기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후기노인의 건강보험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재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은 초기노인과 후기노인 모두 의료비 지출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영향력은 초기노인에서 더 크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속도는 후기노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후기노인이 초기노인보다 만성질환 악화가 더 심하고 이로 인한 입원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영향으로 기인할 것으로 유추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요인은 연령, 장애여부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이 초기노인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요인은 후기노인의 건강상태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가 있는 초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더 빠르게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장애로 인한 건강악화가 비교적 노년 전기에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은 후기노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는 후기노인에서 만성질환이 더 많이 악화되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장애노인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연구주제인 발달궤적 분석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은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빠지는데, 초기 입원이용일수와 의료비 지출이 적은 노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입원이용일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입원이용일수는 느리게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입원이용일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입원이용일수는 의료비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와 입원서비스 이용 증가는 가속화되는데, 이는 초기노인 보다는 후기노인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노인의 만성질환과 장애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적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초기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와 입원이용일수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평준화 현상이 발생하나, 후기노인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전기 시기에 건강상태를 잘 관리한 상태에서 노인후기에 접어들 경우 노인 전기 때의 건강상태를 후기 노인시기까지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고, 입원이용일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노인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후기 노년기에 접어들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를 생각할 때 노인의 입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의료비 지출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수준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변화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입원이용일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자원요인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인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정책과 의료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시행되어 노인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비 지출에는 의료보장, 경제활동 여부 및 소득수준 등 자원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대상노인이 건강보험대상노인보다 의료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이 낮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불균형을 비교적 잘 보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 후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 의료보장 정책은 유지 보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하였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였으므로 신체적 기능이 허락하는 한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시기별로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건강보험대상자의 입원이용일수가 더 많고, 의료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는 후기노인의 만성질환이 주관적 건강상태악화뿐만 아니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노년과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위하여 만성질환 발병이 시작되는 중년 또는 노년전기부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만성질환으로 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특히 후기노인의 건강보험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만성질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모형에 포함된 소득,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수, 혼인상태 관련변수들은 개념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변변수들이므로 시변 변수로 모형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시변변수로 모형화하여 입원이용일수,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 궤적과 예측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료패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한계로 의료비 지출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그리고 약값 등 직접의료비 부분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노인 의료비 지출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비와 의료이용에 필요한 간접의료비를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 궤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래 서비스 이용과 응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 후 연구에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및 분석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확대 앤더슨 모형(Andersen, 1995)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환경적 요인과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행태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나 환경적 요인과 건강행태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확대 앤더슨 모형(Andersen, 1995)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의 자원요인과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욕구요인에 다시 영향을 주는 환류경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의 한계로 이러한 환류모형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류경로도 모형에 포함하여야 예측요인과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에 대한 발달궤적간의 상호관계와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유사한 연구의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2011). 손에 잡히는 의료심사평가 길잡이 보고서,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45010000&cmsurl=/cms/open/04/02/03/01/1207950_24994.html&subject=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 #none에서 2015.10.15. 인출.
, &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51, 95-124. [PubMed]
, , & (1994). Symbiotic relationships of quality of life,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other health research. Quality of life Research, 3(5), 365-371. [PubMed]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3), 1-10. [PubMed]
, , , & (1992). An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care expenditure: a cross-section study of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1(1), 63-84. [PubMed]
, , , & (1997). Predicting Health Care Utilization in the Very Old. The Role of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ttitudinal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9(1), 3-27. [PubMed]
, , & (2002). Do older adults expect to age successfully? The association between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and beliefs regarding healthcare seek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0(11), 1837-1843. [PubMed]
, , , , , & (2004). What influences self-perception of health in the elderly? The role of objective health cond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sense of coherence.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39(3), 227-237. [PubMed]
, , & (2002). Prevalence, expenditures, and complications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n the elderl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2(20), 2269-2276. [PubMed]
, & (1991). The use of health services by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6(6), S345-S357.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3-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3-23

- 3204Download
- 2023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