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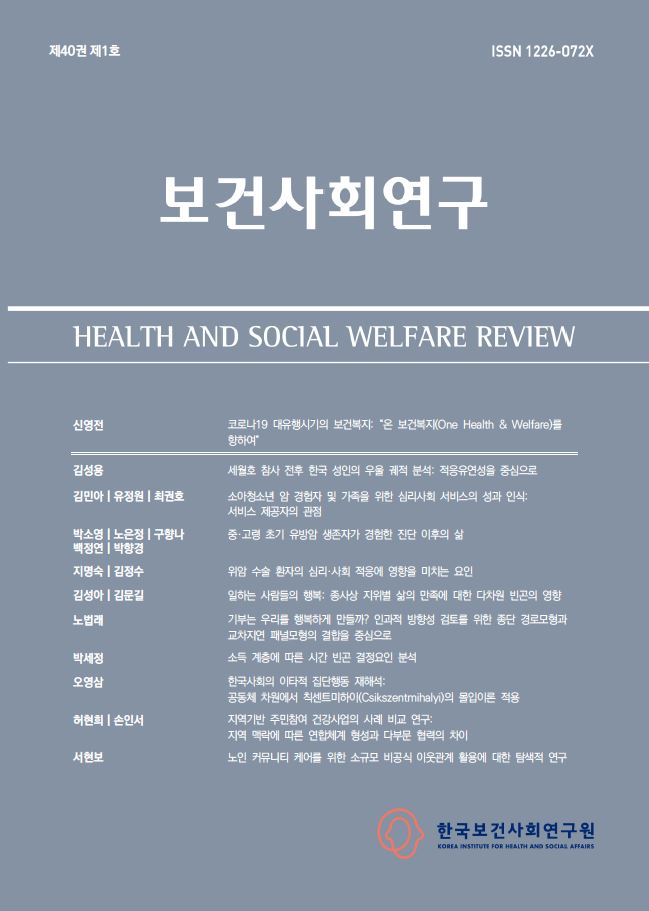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청소년 사용 담배 유형 선택 요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Type of Cigarette Smoked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Conventional Cigarette and Electronic Cigarette
Her, Wonb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0, No.1, pp.489-519, 31 March 2020
https://doi.org/10.15709/hswr.2020.40.1.489
Abstract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e harm of e-cigarettes, the prevalence of use of e-cigarettes have been increasing. E-cigarette companies try to attract adolescents to by claiming that e-cigarettes are a way to quit smoking; however, it is uncertain that e-cigarettes help smoking cessation. In addition, existing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re facing a challenges due to appearance of e-cigarettes.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olicies on e-cigarette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adolescents’ choice of the type of cigarettes they use. Adolescents who use e-cigarettes have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more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e at home and school, cessation intention raised by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ays of secondhand smoke in public places, and ease of cigarette purchas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s. Lastly, implications for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mong adolescents were discussed.
초록
전자담배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활용해 청소년 흡연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전자담배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흡연 예방 및 규제 정책은 도전을 맞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통하여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예방 및 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사용 담배유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 경제상태, 가정 내 및 학교 실내 간접흡연,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가 높아질수록, 일반담배에 비하여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일 수, 최근 30일 동안 담배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2018년 현재, 한국의 전자담배 점유율은 11.3%이고(기획재정부, 2018)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은 7.9%(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이다. 청소년 중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3년간 약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Cho, Shin, & Moon, 2011; Lee et al., 2014). 전자담배 사용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청소년과 청년집단에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Camenga et al., 2014; Durta & Glantz, 2014; Pokhrel et al., 2014; Sutfin et al., 2013).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는 상호 간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Grana, & Glantz, 2013; Morgenstern et al., 2018). 예를 들어, Lee 외(2013)는 일반담배를 사용한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역으로 Primack 외(2015)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이들의 일반담배 사용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8배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상호 간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상호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이루어졌는데 Morgenstern, Nies, Goecke, Hanewinkel(2018)는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담배 사용을 이끌게 된다고 본 반면, Brose 외(2015)는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기 위하여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담배가 전자담배보다 선행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는 상호 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자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Lee, Kim, Min, Hahm(2017)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경험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고, 화이트칼라 직종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 경험률이 높은 집단은 금연시도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영, 왕진우, 이준협, 임국환(2013)의 연구에서도,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년이 낮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인 행복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영(2013) 역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고, 본인의 학교 성적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와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 간의 특성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사용 간의 관계(Barnett et al., 2015; Durta & Glantz, 2014; Warneer, 2016)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사용자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단순히 사용자 간 인구학적 요소들만을 비교하거나(김은영, 2013; Kim, Min, & Hahm, 2017) 또는 금연 시도 여부만을 살펴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왕진우, 이준협, 임국환, 2013).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역시 사용 담배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는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인식하였다(최령, 황병덕, 2016). 또한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에서 허용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Kim, Yun, & Jee, 2011). 그뿐만 아니라 흡연의 유해성을 경각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부착 의무화의 경우 궐련형 일반담배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보다 2년 후인, 2018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담배 사용자와 비교하여 전자담배 사용자는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에 대한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자는 일반 담배 사용자만큼 이를 체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식할 기회 역시 적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이 일반 담배 사용자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흡연 예방 및 규제 관련 정책들이 사용 담배 유형에 따라 흡연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흡연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과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이 개인적 요인(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인지 특성)과 사회적 요인(간접흡연 경험 정도, 흡연 규제 및 금연 관련 정책 경험과 수용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따른 효과적이고 맞춤화된 흡연 예방 및 규제 관련 실천적・정책적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흡연행동은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되어왔으나, 크게 개인적 요인에 의해 흡연행동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이론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흡연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흡연 행동에 대하여 행동적(behavioral), 규범적(normative), 그리고 통제적(control) 신념을 가진다(Ajzen, 1985). 그리고, 행동적 신념은 흡연 행동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만들어 내고, 규범적 신념은 흡연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을, 통제적 신념은 흡연과 관련된 인지된 행동적 통제를 만들어 낸다(Ajzen, 1985).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적, 규범적, 통제적 신념이 모두 결합함으로써 흡연 의도(intention)가 만들어지고, 이는 이후 흡연 행동(behavior)으로 전환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흡연 행동을 설명한 Armitage and Conn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 역시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흡연행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한 개인은 주변 친구, 동료와 같이 의미 있는 주변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흡연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Bandura, 1977). 실제, Garrett와 Williams(2012) 그리고 Sherman와 Primack(2009)는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인이 타인의 흡연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결과적으로 흡연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주로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되어왔다. 반면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설명하는데 기존 흡연행동 관련 이론만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Kralikova 외(2013)의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일반 담배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으며, 일반담배와 달리 사용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림 외(2017)에서도 청소년 흡연자는 일반 담배 사용과 관련한 규제(예: 금연구역)에서 벗어나고자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더해 일반 담배값을 절약하고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보면, 전자담배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와 다른 전자담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모두 담배라는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일반담배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난다. Saddleson 외(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Goniewich와 Zielinska-Danch’s(2012)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54.8%는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 사용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흡연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담배의 한 “유형”으로서 전자담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는 일반담배와 다른 담배의 한 “유형”으로 전자담배의 사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Warner(2016)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전자담배 사용 빈도는 일반 담배의 흡연량과 함께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Morgenstern, Nies, Goecke, & Hanewinkel(2018)도 전자담배를 먼저 사용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후 일반 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2배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복합흡연자(dual user)의 등장으로 전자담배 또는 일반담배로 구분하여 담배의 각 유형만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은 복합흡연자(dual user)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이윤경과 류소연(2018)은 복합흡연의 위험요인으로는 성별, 대도시 거주 유무, 하루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 최초흡연 경험시기, 간접흡연 경험 유무, 음주경험 유무, 일주일간 용돈 수준을 꼽았다. 또한 Jeon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복합사용자들은 남자일 가능성,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할 가능성, 형제자매가 흡연을 할 가능성, 그리고 학교 교사의 흡연 목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진우, 이철민, 김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와 복합사용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이고 고등학교 학생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흡연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복합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 이외에도 전자담배의 건강 영향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e.g., 조준호, 2013; 최은진, 2014; Hajek, et al., 2014)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일지라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무해하지는 않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박명배, 2019). 그 외에 일반담배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다양한 규제들이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언하는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었다(박명배, 2019; 이철민, 김성렬, 정유석, 2018; 조준호, 2013).
2.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및 규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199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담배규제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비준한 2005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법 등을 개정하는 등 더욱 강화된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선혜 외, 2017).
담배규제정책은 가격정책과 비 가격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영수, 2012),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격정책으로는 담배가격 인상이 있으며 비 가격정책으로는 금연구역 설정 및 확대,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발암물질 등 유해정보 내용 확대, 담배광고 금지 및 제한을 통한 규제,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금연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금연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및 교육활동 시행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금연구역 설정 및 확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담뱃갑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는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먼저,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통해 일부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2015년부터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시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Bandiera et al., 2011)는 금연구역 설정 및 확대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WHO의 FCTC에서는 담배규제정책의 일부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담배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박순우, 2007). 그러나, 2018년(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담배구입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약 73%는 큰 어려움 없이 담배를 살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부착 의무화는 흡연에 대한 인식이 흡연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오미영, 2010).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정체성이 미완성된 청소년에게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회・심리적 소구(Psychological appeal)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예방하고 규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Pechmann et al., 2003; Schoenbachler & Whittler, 1996). 실제, 김보라와 권영주(2019)의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 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부착 의무화가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 간의 구분을 통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백재용 외(2019)의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이 일반담배 사용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왕진우 외(2014)의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복합사용 청소년을 비교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묶어 살펴봄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 각각이 가지는 특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윤경과 류소연(2018)의 연구에서는 복합 흡연자와 한 개의 유형만을 사용하는 단일흡연자로 흡연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묶었고, 결과적으로, 단일흡연자가 가지는 특성이 과연 전자담배 사용자의 특성인지 아니면 일반담배 사용자의 특성인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사용자 간의 인구학적 요인 및 금연 관련 요인만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흡연 예방 및 규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Jeon 외(2016)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자, 일반담배 사용자, 복합사용자로 대상을 세분화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나이, 성별, 학교유형, 전공분야)과 흡연행동관련요인(부모, 형제, 친구 흡연, 학교 교사의 흡연 목격)만을 살펴봄으로써 흡연 예방 및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이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따라서 흡연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자를 일반 담배 사용자와 전자담배 사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사용자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합 사용자 및 비흡연자는 제외하고 단일 흡연자 중에서, 일반 담배 사용자와 전자담배 사용자들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자 간의 차이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 특히 흡연 관련 규제 및 정책들과 관련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에서의 차이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흡연 예방 및 규제와 관련한 정책들이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위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 요인(성별, 학년, 가정 경제 수준, 학업성적,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요인(가정 내, 학교 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일수, 담배 구매 용이성,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건강 위해 인식 정도,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설계
본 연구는 제 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 2018)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흡연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별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설명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원시 자료 사용 승인절차를 거친 후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흡연 등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다. 원시자료의 목표 모집단은 2018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모집단 전체 수는 2018년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2,823명을 대상이며, 표본 수는 모집단의 95.6%인 800개교의 60,040명이다.
3. 연구내용
제 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의 103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97개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사용담배 유형별 흡연자는 “최근 30일 동안의 흡연일수”와 “최근 30일 동안의 전자담배 사용 일수”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비흡연자)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한 경우(복합흡연자)를 제외한 응답자를 각각 일반담배 현재 사용자와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적 상태,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성적, 주관적 건강인지,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적 요인에는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 실내 간접흡연, 공공장소 내 실내 간접흡연 문항과 최근 30일 동안의 담배 구매 용이성, 담뱃갑 경고 그림을 통한 건강 위해 인식 정도, 담뱃갑 경고 그림을 통한 금연 의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요인 별로 활용된 질문 문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요인 별 질문 문항
| 구분 | 세부요인 | 질문 문항 |
|---|---|---|
| 개인적 요인 | 성별 |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
| 학년 |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
| 가정 경제 수준 |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 |
| 학업성적 |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 |
|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
| 주관적 건강인지 |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사회적 요인 | 가정 내 간접흡연 |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며칠입니까? |
| 학교 실내 간접흡연 |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교실, 화장실, 복도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날은 며칠입니까? | |
|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 최근 7일 동안, 집 또는 학교가 아닌 실내(상점, 식당, 쇼핑몰, 공연장, 피시(PC)방, 노래방 등)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날은 며칠입니까? | |
| 담배 구매 용이성 |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 |
|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건강 위해 인식 정도 |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까? | |
|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 의지 |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본인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 흡연자와 일반담배 사용 흡연자의 수는 총 1,141명이며 구체적인 연구대상 흡연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총 1,141명 중 남자는 78%로 여자보다 2.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고등학교 3학년이 34.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이 1.1%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상태를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학업성적의 경우 “하” 또는 “중하”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한 편”과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였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조금”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약 70%를 차지하였고 평상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 흡연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담배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 특성 | 구분 | 담배유형(명)
|
전체(명) | 백분율(%) | χ2 / t | |
|---|---|---|---|---|---|---|
| 전자 | 일반 | |||||
| 112 | 1029 | 1141 | 100 | 2.475 | ||
| 성별 | ||||||
| 남 | 94 | 797 | 891 | 78.1 | ||
| 여 | 18 | 232 | 250 | 21.9 | ||
| 학년 | 8.774 | |||||
| 중1 | 3 | 9 | 12 | 1.1 | ||
| 중2 | 10 | 64 | 74 | 6.5 | ||
| 중3 | 18 | 107 | 125 | 11.0 | ||
| 고1 | 22 | 211 | 233 | 20.4 | ||
| 고2 | 25 | 282 | 307 | 26.9 | ||
| 고3 | 34 | 356 | 390 | 34.2 | ||
| 가정 경제 수준 | 12.651* | |||||
| 하 | 2 | 50 | 52 | 4.7 | ||
| 중하 | 10 | 180 | 190 | 16.7 | ||
| 중 | 48 | 441 | 489 | 42.9 | ||
| 중상 | 33 | 256 | 289 | 25.3 | ||
| 상 | 19 | 100 | 119 | 10.4 | ||
| 학업성적 | 3.644 | |||||
| 하 | 24 | 282 | 306 | 26.8 | ||
| 중하 | 29 | 283 | 312 | 27.3 | ||
| 중 | 30 | 225 | 255 | 22.3 | ||
| 중상 | 18 | 167 | 185 | 16.2 | ||
| 상 | 11 | 72 | 83 | 7.3 | ||
|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 3.448 | |||||
| 전혀 느끼지 않음 | 3 | 23 | 26 | 2.3 | ||
| 별로 느끼지 않음 | 21 | 138 | 159 | 13.9 | ||
| 조금 느낌 | 44 | 399 | 443 | 38.8 | ||
| 많이 느낌 | 32 | 318 | 350 | 30.7 | ||
| 대단히 많이 느낌 | 12 | 151 | 163 | 14.3 | ||
| 주관적 건강인지 | 17.902** | |||||
|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 | 3 | 4 | 7 | 0.6 | ||
| 건강하지 못한 편 | 15 | 228 | 243 | 21.3 | ||
| 보통 | 15 | 228 | 243 | 21.3 | ||
| 건강한 편 | 41 | 409 | 450 | 39.4 | ||
| 매우 건강한 편 | 46 | 300 | 346 | 30.3 | ||
| 가정 내 간접흡연 | 32.082*** | |||||
| 최근 7일 동안 없다 | 51 | 680 | 731 | 64.1 | ||
| 주 1일 | 9 | 61 | 70 | 6.1 | ||
| 주 2일 | 12 | 57 | 69 | 6.0 | ||
| 주 3일 | 17 | 56 | 73 | 6.4 | ||
| 주 4일 | 6 | 27 | 33 | 2.9 | ||
| 주 5일 | 2 | 20 | 22 | 1.9 | ||
| 주 6일 | 3 | 10 | 13 | 1.1 | ||
| 매일 | 12 | 118 | 130 | 11.4 | ||
| 학교 실내 간접흡연 | 9.183 | |||||
| 최근 7일 동안 없다 | 62 | 654 | 716 | 62.8 | ||
| 주 1일 | 11 | 53 | 64 | 5.6 | ||
| 주 2일 | 8 | 44 | 52 | 4.6 | ||
| 주 3일 | 6 | 54 | 60 | 5.3 | ||
| 주 4일 | 5 | 23 | 28 | 2.5 | ||
| 주 5일 | 4 | 38 | 42 | 3.7 | ||
| 주 6일 | 1 | 15 | 16 | 1.4 | ||
| 매일 | 15 | 148 | 163 | 14.3 | ||
| 공공장소 실내 흡연 | 32.533*** | |||||
| 최근 7일 동안 없다 | 34 | 272 | 306 | 26.8 | ||
| 주 1일 | 23 | 78 | 101 | 8.9 | ||
| 주 2일 | 17 | 131 | 148 | 13.0 | ||
| 주 3일 | 12 | 136 | 148 | 13.0 | ||
| 주 4일 | 9 | 69 | 78 | 6.8 | ||
| 주 5일 | 5 | 56 | 61 | 5.3 | ||
| 주 6일 | 1 | 31 | 32 | 2.8 | ||
| 매일 | 11 | 256 | 264 | 23.4 | ||
| 담배 구매 용이성 | 48.015*** | |||||
|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적이 없다 | 67 | 293 | 360 | 31.6 | ||
|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 7 | 100 | 107 | 9.4 | ||
|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2 | 96 | 98 | 8.6 | ||
| 조금만 노력하면살 수 있었다 | 15 | 256 | 271 | 23.8 | ||
|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 21 | 284 | 305 | 26.7 | ||
| 담뱃갑 경고그림 건강위해 | 10.968* | |||||
|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 15 | 131 | 146 | 12.8 | ||
| 약간 생각했다 | 31 | 398 | 429 | 37.6 | ||
| 많이 생각했다 | 28 | 283 | 311 | 27.3 | ||
| 매우 많이 생각했다 | 38 | 217 | 255 | 22.3 | ||
|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의지 | 32.656*** | |||||
| 전혀 생각하지않았다 | 20 | 225 | 245 | 21.5 | ||
| 약간 생각했다 | 29 | 450 | 479 | 42.0 | ||
| 많이 생각했다 | 23 | 196 | 219 | 19.2 | ||
| 매우 많이 생각했다 | 40 | 158 | 198 | 17.4 | ||
| 사용 담배 유형 별 흡연자 수 | ||||||
| 일반담배만 사용 | 0 | 1029 | 1029 | 90.2 | ||
| 전자담배만 사용 | 112 | 0 | 112 | 9.8 | ||
*p<.05, **p<.01, ***p<.001
간접흡연 경험 일수와 관련하여 최근 7일 동안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64.1%로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으로 매일 간접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11.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62.8%로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는 매일 경험한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7일 동안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26.8%였지만 23.4%는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을 “매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구매할 때, 응답자의 26.7%는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9.4%만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배구매를 시도한 응답자의 약 85%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12.8%는 “전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22.3%는 “건강에 해롭다고 매우 많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다고 약간 생각”한 비율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21.5%의 응답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차분석 결과 가정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인지, 가정 내 간접흡연,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담배 구매 용이성, 담뱃갑 경고그림 건강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 의지 변수만이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사용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 예측 요인
가. 모형의 적합성 검증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예측성 검정 값은 92.234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을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 지수인 Nagelkerke R²는 .164으로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 변화량의 약 16%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goodness of fit test)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의 검정값(10.144)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만한 수준의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에 의하여 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률은 90.2%로 나타났다.
표 3.
사용 담배 유형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성 검증
| 관찰값 | 일반담배 | 전자담배 | 분류정확도 |
|---|---|---|---|
| 일반담배 | 1026 | 3 | 99.7 |
| 전자담배 | 109 | 3 | 2.7 |
| 전체(%) | 90.2 | ||
| X² | 92.234*** | ||
| Hosmer & Lemeshow | 10.144(.255) | ||
| -2 Log 우도 | 640.384 | ||
| Cox & Snell R² | .078 | ||
| Nagelkerke R² | .164 |
*p<.05, **p<.01, ***p<.001
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사용하는 담배 유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을 종속변수로,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Wald 값, Exp(B)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각 예측 변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통계치
| B | S.E | Wald | p | Exp(B) | ||
|---|---|---|---|---|---|---|
| 개인적 요인 | 성별 | -0.186 | 0.295 | 0.400 | 0.527 | 0.830 |
| 학년 | -0.067 | 0.078 | 0.730 | 0.393 | 0.935 | |
| 가정경제수준 | 0.421 | 0.115 | 13.451 | 0.000*** | 1.523 | |
| 학업성적 | 0.016 | 0.087 | 0.033 | 0.855 | 1.016 | |
| 스트레스 | -0.064 | 0.116 | 0.303 | 0.582 | 0.938 | |
| 주관적 건강인지 | 0.013 | 0.126 | 0.011 | 0.918 | 1.013 | |
| 사회적 요인 | 가정 내 간접흡연 | 0.151 | 0.043 | 12.244 | 0.000*** | 1.163 |
| 학교 실내 간접흡연 | 0.097 | 0.047 | 4.323 | 0.038* | 1.102 | |
|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 -0.201 | 0.049 | 16.532 | 0.000*** | 0.818 | |
| 담배구매용이성 | -0.301 | 0.069 | 19.073 | 0.000*** | 0.740 | |
| 담뱃갑 경고그림 위해 | -0.195 | 0.156 | 1.550 | 0.213 | 0.823 | |
| 담배갑 경고그림 금연의지 | 0.539 | 0.153 | 12.441 | 0.000*** | 1.714 |
*p<.05, **p<.01, ***p<.001
Note: 종속변수의 기준변수는 일반담배 사용 흡연자임. 독립변수의 기준 변수는 다음과 같음(성별= 남, 학년=중1, 가정경제수준=하, 학업성적=하, 스트레스=전혀느끼지 않음, 주관적 건강인지=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 가정 내 간접흡연=최근 7일 동안 없다, 학교 실내 간접흡연=최근 7일 동안 없다,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최근 7일 동안 없다, 담배구매용이성=최근 30일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담배갑 경고그림 위해=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담배갑 경고그림 금연의지=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가정경제수준, 가정 내 간접흡연,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용이성,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의지의 경우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실내 간접흡연의 경우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 실내 간접 흡연,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의지는 높아질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과 담배구매 용이성은 높아질수록 전자담배 사용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상태가 1단위 높아질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약 1.5배(52%) 증가하였으며, 가정 내 간접 흡연 일수가 1일씩 증가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1.16배(약 16%) 증가하였다. 학교 실내 간접흡연 일수도 1일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1.10배(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의 경우 간접흡연 일수가 1일 증가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담배 구매가 쉬울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은 약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의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약 1.71배(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독립변수들을 상수로 통제했을 때,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으며, 가정 내 간접흡연 일수가 많고, 학교 실내 간접흡연 일수가 많고, 담배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일수가 증가하고, 최근 30일 동안 담배 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은 감소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흡연 청소년의 사용 담배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 및 규제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첫째, 개인적 요인 중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전자담배 사용을 위한 초기 비용이 일반 담배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일반담배와 비교하여 볼 때, 전자담배 초기 기계 구입 비용은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2만원이 추가로 든다. 따라서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전자담배 사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불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기존 연구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흡연 청소년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 경제 수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예: 최선혜 외, 201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흡연자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따라 흡연자를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로 구분할 경우,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것처럼 낮은 경제 수준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요인인 반면, 높은 경제 수준은 사용하는 담배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간접흡연 관련 요인(가정 내, 학교 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들은 모두 전자담배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의 실내 간접흡연 일수의 증가는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일수 증가는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 일수가 높다는 것은 가정 내 흡연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주 흡연자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흡연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예: 조규희, 목형균, 2019; Kang & Kim, 2005; Jester et al., 2019)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 될수록 흡연자 될 가능성 높다(e.g., Okoli et al., 2016)는 점에서, 부모의 가정 내 흡연은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이끌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Huh et al., 2013; Nguyen, 2012) 가정 내 부모의 흡연이 청소년인 자녀의 흡연 역시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Zhu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흡연자들의 55%는 가정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흡연자가 되었으나, 일반 담배의 사용이 가정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고(Pepper et al., 2014), 쉽게 숨길 수 있는(Delano, 2017) 전자담배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 실내 간접흡연 일수 역시 증가할수록,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청소년의 흡연은 흡연 친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권석현, 정수용, 2016; 조규희, 목형균, 2019). 그리고 실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 “친구”(한미연, 2012; Kinnunen et al., 2014; Pentz et al., 2015)의 전자담배 사용과 그에 대한 “호기심”(69%; Pepper et al., 2014)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부터 학교 역시 금연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학교 내에서 일반 담배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청소년 중 전자담배 사용 경험률은 3년간 20배의 증가를 보였다(Cho, Shin, & Moon, 2011; Lee et al., 2014). 즉, 학교 내에서 일반담배보다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였고, 흡연 친구의 전자담배 사용에 의한 간접흡연을 학교 내에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간접흡연일수의 증가는 전자담배 사용의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통해 이 결과를 논의해 볼 수 있다. 공공장소 내 간접 흡연일수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많이 목격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흡연 행동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규범화(normalization)”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약,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김혜련, 2016).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일수가 높음으로 인해서 흡연행위에 대한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일반담배의 사용을 “규범화”하는 동시에 전자담배로의 대체를 필요 없게 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을 낮추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록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담배구매 가능연령은 만 18세이며, 법적으로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인터넷 등에서 신분확인절차 없이 구매가 가능한 전자담배를 대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양유선 외, 2016). 그러나, 실제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제14차)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담배구매를 시도한 청소년들의 약 73%는 큰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결국 전자담배 구매와 일반담배 구매 용이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굳이 일반담배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높게 가진 청소년들은 일반담배보다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컸다. 실제 Dunlop, Lyons, Dessaix, Currow(2016)가 실시한 연구에서, 흡연자 중 25%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건강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Pepper, Ribisl, Emery, Brewer(2014)의 연구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48%는 일반담배를 금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전자담배의 일종인 아이코스의 제품명이 I Quit Ordinarly Smoking(IQOS)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담배들은 금연 및 절연을 위한 제품인 것처럼 마케팅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덜 해로우며” “금연보조제”의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퍼져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반담배를 사용하던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금연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보다 덜 해롭다고 믿어지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먼저, 본 연구는 비흡연자를 포함하지 않고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선정편향(sample selection bias)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일반담배 사용자는 1,029명인 반면, 전자담배 사용자는 10분의 1 정도에 미치는 112명으로 집단 간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흡연자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연구대상 선정편향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 사용자의 비율을 유사하게 맞추어 보다 정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2018년(제14차)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양적 연구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 사용여부에 대한 문항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작 시기 및 진행 경로 등에 대한 이해는 제한이 된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는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위해(危害) 인지 정도는 전자담배의 사용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양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다소 제한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 뿐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이 함께 병행됨으로써 양적 연구방법의 본질적 한계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 진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흡연 관련 규제 및 정책(간접흡연, 구매용이성, 경고그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외에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 예를 들어 담배 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흡연 관련 요인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포함해 사용하는 담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정부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에 비해 95% 덜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며, 전향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며(McNeill et al., 2015), 미국은 전자담배 규제 규칙 지정을 2022년으로 연기한 상황이다(Fairchild et al., 2018). WHO의 경우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기에, 제한된 근거로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한 상황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14). 따라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바르게 잡아줄 실천적・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흡연청소년은 일반 담배구매 또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자담배를 “대신”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담배의 “대체제”로서 전자담배가 인식되지 않도록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시행되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기획재정부. (2018). 2018년도 11월 담배 시장 동향.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3081 에서 2020. 1. 20. 인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성인남성 흡연율, 지속 하락.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7768&page=1 에서 2020. 1. 20. 인출.
연. (2019. 01. 25.). 작년 담배 판매 1.5% ↓ ... 궐련 3억갑 줄고 전자담배 3.3억갑 팔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43800002?input=1195m에서 2020. 1. 20. 인출.
(2017). New e-cigarette popular among kids, easy to conceal from parents. https://pittsburgh.cbslocal.com/2017/12/13/new-ecigarette-popular-among-kids-easy-to-conceal-from-parents/에서 2020. 1. 20. 인출.
, , , , , & (2015. cited 2018 Feb 19). E-cigarettes: an evidence updat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e-cigarettes-an-evidence-update. place unknown: Public Health Eng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14).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Internet]. 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10-en.pdf에서 2018. 2. 19. 인출.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9-10-29
- 수정일Revised Date
- 2010-01-07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0-01-21

- 3845Download
- 8868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