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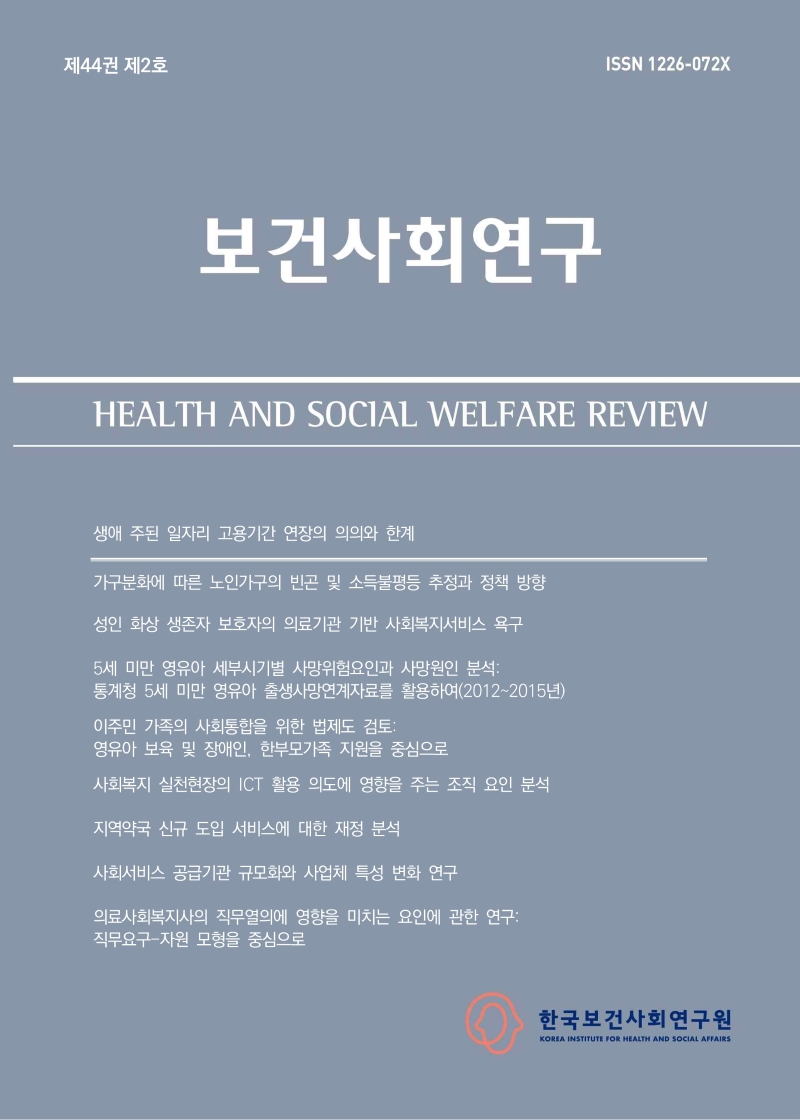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Impa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협력에 중요한 사회적 역량으로, 청소년기의 공감 발달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스마트폰 과의존은 초기 청소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매개로 하여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초기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와 초기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의 촉진 전략을 통해 심리적 친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애착의 증진과 스마트폰 과의존 관리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공감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empathy. Data were collected from 1,303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s part of the 14th (202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using JAMOVI 2.3.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athy, whereas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athy. Second, both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mediated the negative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empathy. Third,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athy through the sequential dual mediati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e not only directly affects empathy but also indirectly affects it through sequential meditati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Therefore, to enhance empathetic ability in early adolescence, it is necessary to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systemic programs and strategies to improve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Additionally, maternal attachment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suggesting that maternal attachment should be particularly emphasized as a strategy to improve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초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제14차(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중학교 1학년 대상 1,30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JAMOVI 2.3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유의한 부적 매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를 통해 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며,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감에 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공감 향상 전략으로서 모애착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Eisenberg & Fabes, 1990). 즉,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알고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고통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불편함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측면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측면까지 포함되는 복합적 개념이다(홍예영, 김유숙, 2015). 따라서 공감 능력은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협력을 위한 필수적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타고난 것이 아닌 생후 초기에 나타나 부모, 친구,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달한다 (McDonald & Messinger, 2011). 청소년기 공감 발달은 이타성 및 사회성을 촉진하여 친사회적 행동,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오은주, 남재걸, 2017; 조한익, 이미화, 2010). 또한 청소년 시기의 공감 능력은 성인기까지 유지되어 변하지 않으며 성인기의 사회적 역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Allemand et al., 2015),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 발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감과 소통이 중요한데, 최근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 접촉 없이도 비대면 온라인 접촉을 통한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에게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에 의한 소통의 기회 감소, 인간관계 속에서의 직접적 학습 경험의 박탈로 인한 공감 발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지연, 최아리, 2017). 2007년 스마트폰의 첫 등장 후 스마트폰 보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해 이제는 10대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기능에서부터 각종 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사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나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쉽게 이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며, 중독 행동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기는 낮은 자제력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을 성인보다 더 많이 하는데 초기 청소년기에 사용량이 특히 많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있었고, 중학생이 45.4%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초·중·고 중에서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유사하게 금단 증상과 내성을 나타내 일상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불안,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의 악화가 나타나는 행동중독 상태를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도 한다(De-Sola Gutiérrez et al., 2016). 중독 행동은 성장기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Anitha et al., 2021), 정서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ho & Lee, 2017). 공감은 사회적, 가족의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통해 발달하는 일종의 정서지능이기 때문에(Eisenberg & Fabes, 1990; McDonald & Messinger, 2011; Smith, 2006), 스마트폰 과의존은 현실의 실제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 능력의 발달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Parker et al., 2008),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적 관계를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대상의 일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이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며, 친구 관계를 더 촉진 시킨다고도 하였다(Seo et al., 201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폰 이용은 다른 사람과의 면대면 접촉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가족 간에도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면대면 대화 시간의 감소를 유발하였다(김정화, 2014).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가족 간의 친밀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타인과의 관계성 추구를 약화시킴으로써 어머니와의 애정적 관계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보고되었다(Hood et al., 2021; Lepp & Barkley, 2016).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본 연구는 드물지만, 부모-자녀 간 갈등요인이며(김정화, 2014), 부모지지를 약화시킴(서인균, 이연실, 2017)을 보고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애착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Bowlby, 1969)를 의미하며, 인간은 출생시부터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게 되므로 출생 초기의 애착형성이 중요함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특정 대상과의 애착이 중요하며(장휘숙, 2004: Allen et al.,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부모애착에 종적 영향을 미침이 밝혀지고 있다(Therriault et al., 2021). 그러므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청소년의 모애착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모애착은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기반 위에 주변 환경을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이 일찍이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기에도 어머니와의 애착을 안정적 기반으로 삼아 청소년기 주요 과업인 인지적, 정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탐색하게 된다고 밝혀지고 있다(Allen et al., 2003). 따라서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질은 청소년의 공감 능력의 발달에도 기여하여,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촉진시키며(박선하 외, 2014),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있는 청소년은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됨이 최근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김두규, 강문숙, 2017),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인간은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Bowlby, 1969). 자녀의 성장 과정에 대부분 주 양육자이며,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의 애착은 어린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절대적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owlby, 196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어머니와 안정적 친밀감을 느끼고 애정을 주고받는 자녀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기는 비록 이전의 발달 시기에 비해 친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어머니도 여전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모애착 역시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최선우, 김승현, 2015), 관련 기존 연구는 대부분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유의성이 밝혀져 왔다(김미경, 2016; 류수현, 2018; 최혜정 외, 2019). 그러나 이는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성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되지 못한 채 도출된 결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머니와의 애착을 구분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영향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만 11~14세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Rice & Dolgin, 2008), 이 시기에는 이차성징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보다 성숙한 정서 상태에 이르기 위한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특히 더 강조된다. 부모, 친구, 교사, 이웃과의 관계는 초기 청소년이 접촉하는 주된 환경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과 학교 적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신미 외, 2012).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주로 접촉하고 영향을 받은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나타내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관련 대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은 인간관계를 통해 개발되는 공감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으로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오광수, 2017; 최진오, 2015), 공감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연구는 그 예측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김두규, 강문숙, 2017; 김재엽 외, 2011; 고은정, 김병년, 2020; 문두식, 최은실, 2015; 박희경, 권경인, 2012; 최선우, 김승현, 2015), 스마트폰 과의존의 청소년기 발달 관련 부적 영향에 관한 지식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에 영향을 미칠 때 모애착이나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어(이상준, 2017), 공감에 대한 영향에서도 이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예측되는 바,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매개 요인으로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함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Ⅱ. 선행연구
1. 스마트폰 과의존과 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공감과의 관계
스마트폰 과의존과 모애착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은 부모애착과 부정적 관련을 보였으며(Lepp & Barkley, 2016), 최선우, 김승현(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모애착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대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청소년 자녀 간 애착 감소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ood et al., 2021). 질적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부모-자녀 간 반복적 갈등의 요인이었고, 가정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면대면 대화 시간이 많았다(김정화, 201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이상준, 2017).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지지와도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서인균, 이연실, 2017).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머니와 자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화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지지적 역할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애착을 낮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의 흔한 예측인자로서 연구되었다(De-Sola Gutiérrez et al., 2016). 즉,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지적되어왔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은 수면 문제나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위험뿐 아니라 청소년기 흔한 정신적 문제인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에 취약함을 고려할 때(De-Sola Gutiérrez et al., 2016) 자기에 대한 이해 역시 취약할 낮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개념 중 하나인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서인균, 이연실, 2016), 스마트폰 이용 목적 중 하나인 인터넷의 과몰입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약화하는 요인이었다(류수현, 2018). 또한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류수현, 2018), 터키의 고등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문제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şiklar et al., 2013).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어(오광수, 2017), 관련 연구가 아직 많지 않지만,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결함 증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최진오, 2015), 대학생 대상의 일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오광수, 2017). 일 연구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공감에 관여하는 뇌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공감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여(Zhou et al., 2011),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에 대해 뇌신경 발달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다 이용이 현실의 실제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 는 공감 능력의 발달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Parker et al., 2008),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큼을 보고하였다. 또한 Carrier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접속과 청년층의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 온라인 접속 자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비디오 게임과 같은 특정 활동이 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시하였다.
2. 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공감과의 관계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모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최선우, 김승현, 2015). 유사한 연구 결과로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류수현, 2018; 최혜정 외, 2019),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이동욱, 2022).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의 초깃값이 자아존중감의 초깃값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애착의 변화율도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2016). 또한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는 불안정한 성인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이지은 외, 2019). 성인 애착의 안정적인 측면인 애착 친밀이나 애착 의존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애착불안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미현, 김명식, 2013), 안정 혹은 불안정 애착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반대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애착은 자기에 대해 극단적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과 대비되는 개념인 고등학생의 자기 비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자살 욕구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졌다(서보아, 유재봉, 2013).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고 자기 비하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윤미현, 2011).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탄력성과 모애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성희, 이영실, 2014).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모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개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모애착과 공감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에서, 모애착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김두규, 강문숙, 2017). 또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최혜정 외, 2019), 부모애착과 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이현주, 2020).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시기의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은 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김춘경, 김지선, 2016),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의 공감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임수진, 2012),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모애착이나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공감 발달에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부모애착과 유사한 개념과도 공감은 관련을 보였는데,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강경옥 외, 2018).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이거나 반대로 적대적 양육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박선하 외 2014),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 자녀는 공감능력이 높았지만,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반대로 공감 능력이 매우 낮았다(이주혜, 조영아, 2014; 채영문, 곽수진, 2013). 자녀에게 따뜻하며 친밀하게 대하고, 존중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공감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이숙, 류현강,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고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언, 우주영, 2017).
3. 자아존중감과 공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기개념으로서 작용하며, 청소년의 공감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최혜정 외, 2019). 그러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른 연구는 찾기 어려웠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공감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기 자아존중감과 공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됨을 보였다(이숙, 류현강, 2014). 또한 상황에 따라 자아를 통제하는 포괄적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개념 중 하나인 자아탄력성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석언, 우주영, 2017),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공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4.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에서 모애착의 매개효과에 관해 알아본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유사한 연구로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적 영향 관계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과(이상준, 2017)를 통해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완전 매개 영향을 미쳤으며(김재엽 외, 2011),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양육방식과 장애 중학생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모애착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손성화, 강영심, 2018), 선행 연구에서 모애착은 청소년기 부정적 정서와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과의 관계 경로의 완충 역할을 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해 알아본 연구 역시 찾기 어렵지만, 유사한 연구로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던 이상준(2017)의 연구 결과를 통해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여자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능동적 이용과 섭식장애에 미치는 부적 영향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임은영 외, 2023),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에 의한 정신건강 문제의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문제행동과 반대로 친사회적 행동인 봉사활동이 긍정적 자아개념인 자아탄력성과 함께 자아존중감은 공감과 유사한 친사회적 역량인 공동체 의식에 정적 매개 영향을 나타내(김지혜, 2012), 자아존 중감은 청소년기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매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모애착과 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애착과 공감 간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 영향을 미쳤다(최혜정 외, 2019). 또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유아의 공감 능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이숙, 류현강, 2014). 즉, 부모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써 공감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짐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적 관계 경로를 자아존중감이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이상준, 2017).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4차 한국아동패널 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본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사되어 구축되었다. 먼저 6개 권역층(서울, 경기,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의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계통추출법에 의해 총 30개의 의료기관(2006년 기준, 분만 건수 500건 이상)을 추출한 후, 추출된 의료기관의 조사 참여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2008년에 출생한 2,652명의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조사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산모가 18세 이하인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 산모의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신생아 혹은 산모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신생아가 입양 예정인 경우,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는 예비표본에서 제외되어, 1~3차 년도 조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2,150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0세 영아와 부모 패널을 대상으로 200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27년까지를 목표로 매년 종단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아동이 중학교 1학년에 이른 2021년의 제14차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 중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이며,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공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유일한 차수이며,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제14차 자료를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s://kicce.re.kr/pskc/index.do)에서 연구자의 소속과 자료의 사용 목적을 밝힌 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였다.
제14차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 대상(부모, 아동, 교사) 및 내용에 따라 설문지 작성, Web 기반 온라인 설문 혹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대면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제14차 조사에 참여한 1,620 명의 자료 중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1,30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1,303명의 자료 중에서 남학생은 661명(50.7%), 여학생은 640명(49.1%)이었으며, 모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14차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취득한 후 수집된 윤리성이 확보된 자료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제8차~14차 조사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의 정의에 따라 활용 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감이었고, 외생변수는 스마트폰 과의존, 매개변수는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이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가.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광우 외(2011)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일상생활장애 5문항(‘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등),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등), 금단 4문항(‘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진다.’ 등), 내성 4문항(‘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개의 역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856이었다.
나. 모애착
모애착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rmsden &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되고 이정림 외(201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부와 모에 대해 따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의사소통 6문항(‘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등), 신뢰감 3문항(‘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등), 소외감 3문항(‘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총 9문항을 이용하였고, 소외감 3문항은 전체가 부정 문항으로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4미만(Hair et al., 1995)이고,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감 측정 문항 중 한 개의 역 문항(‘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은 역코딩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852였다.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MCS(2012)에서 5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859였다.
라. 공감
공감은 홍예영, 김유숙(2015)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공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본 도구는 표현적 공감 7문항(‘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등), 인지적 공감 4문항(‘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등), 정서적 공감 4문항(‘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등)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925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IBM SPSS 26.0과 JAMOVI 2.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2) 주요 변수의 특성과 정규성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하였으며,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출하여 알아보았고, 4) 측정모형의 검증과 구조모형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평균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1.64점(±0.56)~2.25점 (±0.56), 모애착이 3.84점(±0.76)~3.96점(±0.75), 자아존중감이 3.03점(±0.69)~3.41점(±0.61), 공감은 4.17점 (±0.99)~4.32점(±0.92)이었다. 주요 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은 0.08~0.67, 첨도의 절댓값은 0.05~0.83으로서, 정규성 기준인 왜도 3 미만, 첨도 8 미만에 충족됨을 확인하였다(Kline, 1998).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1,303)
| 변수 | 스마트폰 과의존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공감 | ||||||||||
|---|---|---|---|---|---|---|---|---|---|---|---|---|---|---|
| ➀ | ➁ | ③ | ➃ | ⑤ | ⑥ | ⑦ | ➇ | ⑨ | ➉ | ⑪ | ⑫ | ⑬ | ⑭ | |
| 평균 | 2.10 | 1.64 | 1.80 | 2.25 | 3.84 | 3.96 | 3.09 | 3.16 | 3.03 | 3.41 | 3.26 | 4.20 | 4.32 | 4.17 |
| 표준편차 | 0.50 | 0.56 | 0.54 | 0.56 | 0.76 | 0.75 | 0.66 | 0.66 | 0.69 | 0.61 | 0.66 | 0.91 | 0.92 | 0.98 |
| 왜도 | -0.13 | 0.67 | 0.49 | -0.08 | -0.57 | -0.47 | -0.43 | -0.35 | -0.31 | -0.68 | -0.54 | -0.50 | -0.35 | -0.56 |
| 첨도 | -0.14 | 0.11 | 0.12 | -0.05 | 0.75 | -0.13 | 0.44 | -0.05 | -0.06 | 0.47 | 0.10 | 0.83 | 0.25 | 0.63 |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r=-.24, p<.001), 자아존중감(r=-.27, p<.001) 및 공감(r=-.2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모애착은 자아존중감(r=.38, p<.001) 및 공감(r=.34,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은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8, p<.001)를 나타냈다. 주요 변수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내성과 정서적 공감만을 제외한 공감과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모애착은 자아존중감 및 공감의 하위영역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공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2).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스마트폰 과의존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공감 | ||||||||||||
|---|---|---|---|---|---|---|---|---|---|---|---|---|---|---|---|---|
| ➀ | ➁ | ③ | ➃ | ⑤ | ⑥ | ➇ | ⑨ | ➉ | ⑪ | ⑫ | ⑭ | ⑮ | ⑯ | |||
| 스마 트폰 과의존 | ➀ | |||||||||||||||
| ➁ | .45** | |||||||||||||||
| ③ | 0.49** | 0.63** | ||||||||||||||
| ➃ | .65** | .40** | .4** | |||||||||||||
| 모 애착 | ⑤ | -.22** | -.23** | -.12** | -.11** | |||||||||||
| ⑥ | -.22** | -.30** | -.23** | -.12**.70** | ||||||||||||
| ⑦ | -.24** | |||||||||||||||
| 자아 존중감 | ➇ | -.23** | -.22** | -.25** | -.21** | .25** | .30** | |||||||||
| ⑨ | -.22** | -.17** | -.15** | -.19** | .30** | .28** | .60** | |||||||||
| ➉ | -.22** | -.15** | -.12** | -.21** | .28** | .23** | .47** | .57** | ||||||||
| ⑪ | -.10** | -.22** | -.17** | -.10** | .32** | .32** | .54** | .54** | .41** | |||||||
| ⑫ | -.14** | -.19** | -.17** | -.12** | .30** | .31** | .64** | .59** | .45** | .70** | ||||||
| ⑬ | -.27** | .38** | ||||||||||||||
| 공감 | ⑭ | -.17** | -.26** | -.17** | -.14** | .30** | .32** | .21** | .25** | .23** | .25** | .23** | ||||
| ⑮ | -.17** | -.25** | -.14** | -.14** | .31** | .31** | .16** | .20** | .25** | .18** | .18** | .60** | ||||
| ⑯ | -.10** | -.22** | -.09** | -0.04 | .30** | .32** | .12** | .12** | .12** | .20** | .17** | .62** | .51** | |||
| ⑰ | -.21** | .34** | .28** | |||||||||||||
2. 전체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노경섭, 201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이 718.00(df=71, p<.001)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NFI(Normed Fit Index)가 0.91(기준값 0.90 이상), CFI(Comparative Fit Index)가 0.92(기준값 0.90 이상), SRMR이 0.05(기준값 0.08 미만), RMSEA는 0.08(기준값 0.1 미만)로 나타나 모든 지수가 기준값에 충족하였다(노경섭, 2019). 또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적재량, AVE(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는 각각 .61~.86(기준값 .5 이상), .52~.70(기준값 .5 이상), .81~.86(기준 값 .7 이상)으로 기준값을 충족하였다(표 3).
표 3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지수
| 변인 | B | β | S.E. | z | p | AVE | 개념 신뢰도 | ||
|---|---|---|---|---|---|---|---|---|---|
| 스마트폰 과의존 | → | 일상생활장애 | 1.00 | 0.73 | - | - | 0.52 | 0.81 | |
| → | 가상세계지향성 | 1.07 | 0.70 | 0.05 | 21.90 | <.001 | |||
| → | 금단 | 1.09 | 0.75 | 0.05 | 23.00 | <.001 | |||
| → | 내성 | 1.07 | 0.70 | 0.05 | 21.90 | <.001 | |||
| 모애착 | → | 의사소통 | 1.00 | 0.81 | - | - | 0.70 | 0.82 | |
| → | 신뢰감 | 1.05 | 0.86 | 0.05 | 21.30 | <.001 | |||
| 자아존중감 | → | 자아존중감1 | 1.00 | 0.76 | - | - | 0.56 | 0.86 | |
| → | 자아존중감2 | 0.98 | 0.76 | 0.04 | 27.00 | <.001 | |||
| → | 자아존중감3 | 0.83 | 0.61 | 0.04 | 21.30 | <.001 | |||
| → | 자아존중감4 | 0.91 | 0.76 | 0.03 | 27.10 | <.001 | |||
| → | 자아존중감5 | 1.09 | 0.83 | 0.04 | 29.50 | <.001 | |||
| 공감 | → | 표현적 공감 | 1.00 | 0.85 | - | - | 0.59 | 0.81 | |
| → | 인지적 공감 | 0.85 | 0.71 | 0.04 | 23.80 | <.001 | |||
| → | 정서적 공감 | 0.93 | 0.73 | 0.04 | 24.10 | <.001 | |||
3.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및 가설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이 718.00(df=71, p<.001)인 점을 제외하고, NFI(Normed Fit Index)가 0.91(기준값 0.90 이상), CFI(Comparative Fit Index)가 0.92(기준값 0.90 이상),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0.05(기준값 0.08 미만), RMSEA 는 0.08(기준값 0.1 미만)로 나타나 기준값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노경섭, 2019).
연구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그림 2),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β=-.33, p<.001), 자아존중감(β=-.19, p<.001) 및 공감(β=-.13, p<.001)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애착은 자아존중감(β=.40, p<.001)과 공감(β=.38,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2, p<.001).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표 5),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β=-.12, p<.001) 및 자아존중감(β=-.02, p=.003)을 매개로 하여 공감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05, p<.001).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를 통해 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02, p=.001).
표 5
연구가설 검증
| 변인 | B | β | S.E. | z | p | 결정 |
|---|---|---|---|---|---|---|
| 직접효과 | ||||||
| 스마트폰 과의존 → 모애착 | -.54 | -.33 | .06 | -9.25 | <.001 | 채택 |
| 스마트폰 과의존 → 자아존중감 | -.26 | -.19 | .05 | -5.73 | <.001 | 채택 |
| 스마트폰 과의존→ 공감 | -.27 | -.13 | .07 | -3.76 | <.001 | 채택 |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33 | .40 | .03 | 11.50 | <.001 | 채택 |
| 모애착 → 공감 | .48 | .38 | .05 | 9.89 | <.001 | 채택 |
| 자아존중감 → 공감 | .19 | .12 | .05 | 3.45 | <.001 | 채택 |
| 간접효과 | ||||||
| 스마트폰 과의존 → 모애착 → 공감 | -.26 | -.12 | .04 | -7.01 | < .001 | 채택 |
| 스마트폰 과의존 → 자아존중감 → 공감 | -.05 | -.02 | .02 | -2.97 | .003 | 채택 |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공감 | .06 | .05 | .02 | 3.38 | <.001 | 채택 |
| 스마트폰 과의존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공감 | -.03 | -.02 | .01 | -3.21 | .001 | 채택 |
Ⅴ. 논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공감에 대한 조사가 유일하게 이루어져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제14차의 중학교 1학년 대상의 1.303명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β=-.33), 자아존중감(β=-.19) 및 공감(β=-.13)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공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영향요인에 대해 주로 탐색해 왔으나(김두규, 강문숙, 2017; 김재엽 외, 2011; 고은정, 김병년, 2020; 문두식, 최은실, 2015; 박희경, 권경인, 2012; 최선우, 김승현, 2015),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청소년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에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스마트폰의 긴 시간 사용이 부모 애착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던 연구(Hood et al., 2021)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머니와 의사소통(이상준, 2017)과 모애착(최선우, 김승현, 2015)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과 모애착과의 영향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려운데, 본 연구는 두 변인 간의 부적 영향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와 면대면 대화를 감소시키고(이상준, 2017),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어머니와의 반복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김정화, 2014),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Işiklar et al. (2013)의 연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오광수(201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따른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기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하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결함의 위험을 증가시키고(최진오, 2015), 대학생의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오광수, 2017)와 일치한다. 또한 유사한 연구로서, 온라인 접속이 성인 초기 청년층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접속 시간이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 시간을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Carrier et al., 2015)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비디오 게임은 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Carrier et al., 2015), 온라인 접속 자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 내용이 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써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탈선의 통로가 되지 않고, 교육적이고 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애착은 자아존중감(β=.40)과 공감(β=.38)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애착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영향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최선우, 김승현,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모애착의 자기 비하에 대한 부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서보아, 유재봉, 2013)와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연구(이숙, 류현강,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더불어 초등학생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감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한 연구(김두규, 강문숙, 2017)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이른 자녀에게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감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2, p<.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향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감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최혜정 외,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아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쳤던 김석언, 우주영(2017)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공감 발달에 중요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역시 향상하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감 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자아개념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공감과의 영향 관계에서 모애착이 부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2),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저해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의 부적 영향 관계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매개 역할을 하였던 선행연구 (이상준, 2017)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영향을 미칠 때의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부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 시킴으로써 공감 능력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던 이상준(2017)의 연구와 유사하다. 즉,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감소가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저해하는 경로로 이어짐을 설명하는 드문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비해 모애착의 본 경로에 대한 매개 영향력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모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또한 모애착과 공감과의 영향 관계에서 정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05), 이는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정적 매개 영향을 미쳤던 최혜정 외(2019)의 결과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모애착의 공감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에 대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외적 요인의 영향력은 감소시키고, 모애착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외적 요인의 영향력은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전략이 매우 강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를 통해서 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공감 능력의 감소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 공감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김지연, 최아리, 2017) 관련 탐색은 아직 드물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청소년 공감 발달의 부적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의 청소년 공감과의 영향 관계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경로를 밝힌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공감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각각의 매개효과 및 모애착에서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해 공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초기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모색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45%)은 여성가족부(2023)의 최근 보고와 같이 전체 중학생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조절 능력 강화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 중재 전략이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개별적 상담 지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다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여성가족부, 202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더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는 자녀와 대부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청소년 자녀의 어려움과 갈등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모애착이 강조되며(Allen et al., 2003), 모애착의 안전 기반 위에 공감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모애착은 어린 아동기일 때에는 물리적 접근과 접촉을 통해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 인지적, 심리적 친밀성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장휘숙, 2004).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신뢰감으로 측정된 모애착이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어머니 대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리적 친밀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이 어머니가 자신의 어려움에 늘 일관되고 따뜻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신뢰감의 형성을 통해 모애착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녀에게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 가지기와 같은 어머니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청소년에게도 혼란의 시기이지만, 어머니 역시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소수연 외, 2014). 그러므로 청소년 어머니 대상의 자녀 양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됨으로써,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된 모애착의 증진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중재 전략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어머니와 자녀 간 소통 체험이나 갈등해결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 유대감을 향상시킨다면, 청소년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 할 수 있는 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의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문화예술, 창작이나 자기개발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전국적 표본 추출에 기반한 자료의 대표성이 높은 제14차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 공감의 영향요인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초점을 맞추어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알아봄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감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하여 해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의 특성상 제공되는 자료에 한정하여 변인을 탐색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감은 제14차 조사에서 처음 자료 수집이 시작되어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14차 조사의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공감에 대해서만 단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공감은 전체 청소년기에 걸쳐 발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감의 변화를 종적으로 살펴보고 공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공감 발달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횡단연구에서 확증하기 어려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횡단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종단연구에서는 사라질 수 있음이 최근 지적되고 있으므로(Maxwell & Cole, 2007), 본 연구에서 공감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변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에 대해 잠재성장모형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등 종단적 관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감 발달의 영향요인으로서 알아본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소통에 있어 스마트폰에 의한 비대면 소통은 강화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이 가진 양면성이 본 연구에서 알아본 공감 외의 다른 심리사회성 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방면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단일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유형(정보검색, 모바일 메신저/SNS 중독, 모바일 게임중독,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등)에 따라 공감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분화하여 알아볼 수 있겠다. 공감과 같은 심리사회성 발달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를 비교하거나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공감 발달에 대한 더욱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영향요인으로서 부모 중 어머니 애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애착의 청소년 공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References
, . 2017. 3. 29., 12세까지 뇌 발달 황금기… 스마트폰 중독 빠를수록 지능·감성 떨어져,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9/2017032900118.html.
. (2023. 5. 30.). 2023 청소년 통계.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
. (2023. 12. 27.). 한국아동패널 제8차~14차 조사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3&manage_idx=27
, , & (2015). Empathy development in adolescence predicts social competencies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83(2), 229-241. [PubMed]
, &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PubMed]
, , , , & (2021). The association of mobile touch screen device use with parent-child attachment: A systematic review. Ergonomics, 64(12), 1606-1622. [PubMed]
, , & (201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school students’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their self-esteem levels. Education, 134(1), 9-14. https://link.gale.com/apps/doc/A346808441/AONE?u=anon~8c75ee73&sid=googleScholar&xid=8773d51a
, & (2007). Bias in cross-sectional analyses of longitudinal mediation. Psychological methods, 12(1), 23-44. [PubMed]
(2012).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s://cls.ucl.ac.uk/wp-content/uploads/2017/07/MCS5_MS_Child-Self-Completion-Questionnaire_CORE_ESNI_FINAL_PRINT.pdf
, , , , , & (2011). Gray matter abnormalities in Internet addiction: a voxel-based morphometry study.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79(1), 92-9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4-08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6-0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6-11

- 2113Download
- 775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