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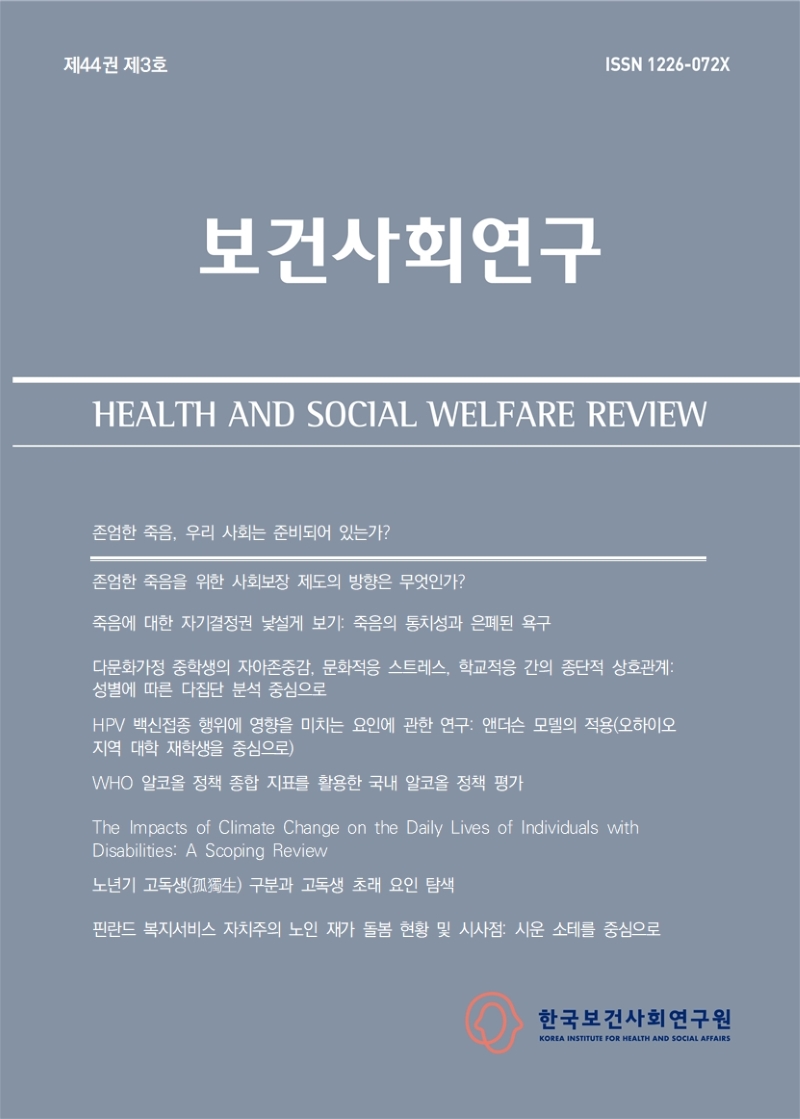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울산의료원 응급사망감소 편익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Benefit Assessment in Public Hospital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Ulsan Medical Center’s Emergency Mortality Reduction Benefit Estimation
Kim, Jin-Hwan1; Jeong, Baekgeun2*
보건사회연구, Vol.44, No.3, pp.383-406,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3.383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는 타당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의 문턱으로 여겨져 온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사람들의 건강 필요에 더 잘 조응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기존에 수행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응급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응급 질환의 범위를 현실과 보다 가깝게 넓히면,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울산의료원과 광주광역시의료원 사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였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의료의 격차와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지금, 공공병원의 가치와 특수성을 고려하는 타당한 경제적 평가와 조사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감염병원에 대응하는 공공병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병원을 지을 때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발전과 형평성, 정책적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Despite long-standing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by building new public hospitals, progress in expanding these facilities remains slo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ften cited as a primary cause of this situation, have sparked arguments that such assessments should be exempted when establishing public hospital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tempted to strengthen public healthcare by implementing these exemptions. However, a change in government led to some hospital projects being reassessed, effectively halting them. This suggests that the strategy of expanding public healthcare through exemptions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implicit limit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articularly the issu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enefit assessment, analyzing the case of Ulsan Medical Center. Our recalculation of the benefits and critical review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public hospitals revealed that the recalculated benefit-cost ratio is higher than initially estimat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onclusions of the reassessment need to be reviewed. The paper aims to ensure tha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rovide meaningful insights for public decision-making that aligns with people's needs, garner broader consensu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healthcare system that transcends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rationality.
초록
공공병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공공병원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두고, 공공병원 설립 시 해당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이전 정권은 면제를 전략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꾀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부 의료원 설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전략이 부분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특히 응급의료 편익 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울산의료원 사례를 분석한다. 그를 위해 편익을 재계산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편익비용비는 기존 추정치보다 크며, 이런 결과는 울산의료원 신설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타당성 재조사의 결론이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공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지식을 제공하고,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서 합의를 끌어내며, 협애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논리를 넘어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Ⅰ. 서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그에 따른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온 여러 시민단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장재완, 2020; 곽성순, 2020).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2018년에는 3개의 공공병원(부산, 진주, 대전)이 다른 사업들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부산),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진주), 대전의료원(대전)과는 달리 울산의료원과 광주광역시의료원은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23년 5월과 11월에 발표된 타당성재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공공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확충하는 데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김경일, 2020; 김민재, 2021; 나백주, 2024), 그런 논의를 반영하여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1)
반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지역 재정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속적인 비판(김태일, 2019; 정동호, 김의준, 2020)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사에 대한 개편이 계속되고 있으나, 편익을 협의의 경제적 편익으로 한정하지 않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략에 대한 논의는 김민재(2021) 정도를 제외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공성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큰 틀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경영전략 설정의 실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미시적 비효율성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설립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효율성 일변의 주장과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공공성 일변의 주장은 각자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병원 설립 문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논점을 구체화하고 다음 논의의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논문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제성평가에 대해 편익 산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을 재계산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제3장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 산정과 관련된 방법론적 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방법론적으로 더 타당한 편익 산정 전략을 택했을 때 타당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Ⅱ.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존 논의
우명동(2022)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사업 시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적 분석제도”로 정의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된 후 2005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로 공식화되었다. 2011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 따라 조사 주체가 다변화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AHP 분석(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처음에는 평가 항목에 대한 사전가중치가 없었으나, 평가자 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모든 사업에 사전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15~25%로 사전가중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점점 더 경제성의 비중을 낮춰 현재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의 기본 범위로 한다(임선, 오동훈, 2018; 정동호, 김의준, 20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다는 비판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전가중치 산정 범위가 분리되었으며 현재 수도권은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사전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다(이호준 외, 2012).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정교해졌을 뿐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 타당성재조사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타당성 재조사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2)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조사이다. 1989년 도입된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1994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제정되면서 타당성재검증 수행 등을 포함한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04년에는 타당성재검증 수행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마련되었다(박현 외, 2004). 이후 타당성 재조사의 일반지침이 개정되고(박현 외, 2012), 2021년에는 세부지침도 마련(여홍구 외, 2021)되며 제도로서 안착해 가고 있다. 다만,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개발된 지침 역시 건축, 도로, 철도, 수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공공병원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조사의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논의로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는 우명동(2022)의 비판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비용편익분석은 잠재가격(shadow price)을 바탕으로 측정, 평가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조사들은 잠재가격을 추정하지 않고, 사회적 할인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 설정의 어려움(김태은, 2017)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이지만 공공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인해 잠재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검토한 김민재(2021)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쟁점으로 현재의 평가 지침이 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편익 항목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는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가치(option value)를 사용하여 편익을 추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 지침의 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최대한을 살피는 대신 대안적 접근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정책적 이행을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긴 호흡에서 추구할 만한 과제들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금의 지침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 편익 추정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편익 산정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변화의 한계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Ⅲ.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의 재평가
1. 편익 재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고려사항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이하 <울산 재조사> 보고서)는 울산의료원 건립요구안과 건립추진단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의 편익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한금용 외, 2023, p. 315).
표 1
울산의료원 건립에 따른 편익의 내용
| 기능 영역 | 편익의 내용 | 울산의료원 편익 산정 | |
|---|---|---|---|
| 진료 영역 | 일반 진료 | 원거리 의료시설로부터 전환에 따른 이동시간 및 교통비 절감 | 이동시간 절감 편익, 교통비용 절감 편익 |
| 특수질환 진료 | 뇌졸중 전문 재활치료 특화에 따른 사회복귀 개선 효과 | 뇌졸중 재활치료와 사회복귀 개선 편익 | |
| 공공의료 영역 | 응급의료시설 확충으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효과 | 응급사망자 감소 편익 | |
| 대규모 감염병의 관리(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른 효과 | 효과적인 결핵 관리에 따른 편익 쯔쯔가무시증의 관리에 따른 편익 |
||
|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건강증진,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 가정간호, 호스피스 등 | 자살사망자 감소 편익, 간병부담 감소 편익, 만성질환관리 편익 | ||
| 울산광역시 미충족 필수의료 개선 효과 | 영아사망 감소 편익, 중독 후유증 감소 편익 | ||
출처: “2023년도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 울산의료원 설립”, 한금용, 김수진, 조창익, 이정철, 정은성, 2023, 한국개발연구원, p. 315.
이에 대해 옥민수(2023, 2024)는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를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제기된 각각의 문제는 타당성 평가의 철학과 관점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 산정의 문제로 범위를 좁힌다. 편익 산정의 방법론적 타당성 때문에 재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다만, 기존에 공개되어 있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현실에 가능한 한 가깝게 편익을 추정해야 하는 경제성 분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심의 등 별도의 과정없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2
옥민수(2023, 2024)에서 제기된 울산의료원 재조사의 문제점
| 분석 영역 | 항목 | 세부 항목 | |
|---|---|---|---|
| 경제성 | 의료원 수요의 제한적 추정 | 응급사망 | 응급사망자 수로 의료원 수요를 제한, 3대 중증응급에 한정된 응급사망 추정 |
| 진료권 설정 | 거리와 이동시간에 기반한 진료권 설정 - 대중교통 거리가 아닌 도로거리 기준,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 부족 진료권 범위에서 인근 지역(경주) 제외 |
||
| 편익 산정의 양적/질적 오류 | 뇌졸중 재활 | 뇌졸중 재활환자 수와 편익의 과소추정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의한 간병비용 절감편익 과소추정 | ||
| 만성질환 관리 | 만성질환 관리의 편익을 당뇨로 한정,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편익을 과소추정 | ||
| 시간단축 | 이동시간 및 교통비용 절감 산정 오류, 시간단축 편익의 주관적 산정 | ||
| 정책성 | 대규모 감염병 유행 관련 필요성에 대한 미평가 | ||
| 지역균형발전 | 경제파급효과로 한정된 분석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음 | ||
이런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응급의료의 편익이다. 응급의료 편익과 관련해서는 3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는 옥민수(2024)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이하 <의료지침>)(김민호 외, 2022)에서도 응급의료 편익을 전체 응급환자 사망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급사망과 3대 중증응급사망의 구성비를 검토하지 않고, 편익 산정에 투입되는 사망의 범위를 3대 중증응급으로 제한하여 응급사망감소의 편익을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발생한 사망이 분류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응급병상 확대를 통해 실제 얻을 수 있는 응급사망감소 편익을 과소추정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두 번째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얻게 되는 중증도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뇌졸중 재활과 관련된 편익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만, 중증도 감소를 통해 얻어지는 편익은 적절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뇌졸중 환자의 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익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의료의 편익 범위 안에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부도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와 간병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따라서, 기존 보고서에서 전체 재원기간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책의 설계를 오인하여 편익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울산 재조사> 보고서 p. 334). 다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간호사들에게 주는 업무 부담 때문에 통상적으로 병원 전체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중증도가 낮고 독립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유지하기 유리한 환자들이 입원한 일부 병동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황수연, 2023)을 고려하면 정책에 대한 오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편익을 과소추정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확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병원 운영계획과의 관련성 안에서 편익 산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당뇨병 관리사업과 관련된 편익 역시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존 보고서처럼 사업의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매해 30%씩 사업의 효과가 체감하여 13년 동안 사업의 효과가 체감하며 지속된다는 상당히 강한 가정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얻어지는 편익이 충분히 크지 않아 재조사의 결론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울산 재조사> 보고서 기준 8,208 백만 원-재분석 기준 14,055 백만 원). 그러나 병원이 지역사회에 더 포괄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 최근의 흐름을 생각하면 해당 사업의 편익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이나 2024년 초의 의사 진료거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편익이 정책성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잔여적인 위치에서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이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익의 형태로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발전의 개념을 경제적 발전으로 좁게 이해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경제파급효과로 한정하여 추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고 새겨들어야 하는 지적이지만, 이 연구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 응급사망 편익 재산정을 통한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재평가
여기까지의 검토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응급사망감소 효과에서 오는 편익의 재산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응급의료의 편익과 관련하여 <의료지침>의 결과를 먼저 재현할 필요가 있다. <의료지침>에 서 응급병상 확충에 따라 응급사망감소의 편익을 산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3).
표 3
<의료지침>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원
<의료지침>에서는 2019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국립중앙의료원, 2020)에 제시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3대 응급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은 KOSIS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별 중 심근경색(I21)은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뇌졸중(I60~I64)은 뇌 혈관 질환(I60~I69), 중증외상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응급사망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되었다는 문제를 제가하려는 것이므로 KOSIS에서 제공하는 것에 더해 통계청 MDIS 서비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사망원인통계 A형 2014~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산출하였다. 사망자 평균연령이 산출된 방식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KOSIS 사망원인통계의 시도 연령별 사망자 수를 이용해서 연령군의 중앙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시도별로 사망자 평균연령을 계산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계산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광역시도에 속한 시군구에 하나의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1) 28개 중증응급사망에서 3대 중증응급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의 산출
<의료지침>에서는 응급사망 편익 산정에 있어 3대 중증응급사망, 그중에서도 도착 전 사망(Dead on Arrival, DOA)을 제외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응급실 접근성이 개선되면 더 이른 시점에 응급실에 도달하여 도착 전 사망했을 환자가 진단명을 부여받은 상태로 죽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착 전 사망을 제외하고 응급사망을 산정하는 방식은 편익을 과소추정한다. 다만 2017~2020년 도착 전 사망을 제외한 울산의 3대 중증응급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31.4명이고, 도착 전 사망을 포함하면 156.0명으로 그 크기가 전체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중증응급사망을 반영하는 대신 3대 중증응급만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응급사망의 협소한 정의는 <의료지침>에서의 설명처럼 응급병상 증가에 따른 응급사망 효과의 산출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응급사망자 수가 예방가능한 사망자 수의 기저가 된다는 점에서 편익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옥민수(2024)의 제안에 따라 전체 응급사망 대신 응급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28개 중증응급질환까지만 범위를 넓혀 사용하였다(부표 1).3) 사망원인을 KCD 코드 단위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 A형은 광역시도 단위로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28개 중증응급사망 대비 3대 중증응급사망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2017~2020년 울산에서 3대 중증응급사망이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27%이다. 따라서 <울산 재조사> 보고서에서 산출한 응급사망 편익은 예방가능한 사망을 산출하는 전체 응급사망의 2/3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실제 편익의 2/3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응급사망 편익 산정 모형의 재현 및 재산정
<의료지침>에서는 연도와 광역시도를 고정효과로,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공변량으로 두고 1㎢당 응급병상수에 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응급사망률에 로그를 취한 값을 결과변수로 놓고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적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의료지침>과 동일하게 시군구별 log(응급병상수/㎢)와 log(사망률)의 그래프4)를 구성하고 연도 고정효과만 들어간 모형 1, 광역시도 고정효과가 추가된 모형 2, 사망자 평균연령이 추가된 모형 3을 각각 적합하여 기존 분석과의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Adjusted R2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후 AIC)과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후 BIC) 지표를 추가로 산출하였다(Chakrabarti & Ghosh, 2011). <부표 2>는 기존 분석 결과와 재현 결과를 보여준다. 상수항과 사망자 평균연령의 계수는 상당히 달랐지만 산출 방식 차이에 의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log(응급병상)의 계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외 추정치와 Adjusted R2 등 모형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들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일치하여 사실상 동일한 모형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분석에 앞서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응급사망의 범위를 좁게 잡았기 때문에 응급사망감소로 인한 편익을 과소추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이 분석에서 <의료지침>에서 사용된 결과변수인 3대중증응급사망률을 그대로 사용해도 사망감소 효과 추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의료지침>에서 사용한 모형을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3대중증응급사망률을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이한 사망으로 대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현재 공개된 자료원 중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중증응급사망자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사망원인통계 A형을 사용해 산출한 시도별 28개 중증응급사망 대비 3대 중증응급사망의 비율을 곱한 값을 결과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광역시도별로 곱해주는 값을 wj라고 하여 전체 중증응급사망을 결과변수로 하는 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을 앞의 식과 동일한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3대중증응급사망률을 전체 중증응급사망률로 변환하기 위해 곱해준 wj는 광역시도의 고정효과에 흡수되어 응급사망감소 효과를 포착하는 계수인 β1‘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3대중증응급사망률을 결과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의 추정치인 β1과 전체 중증응급사망률을 결과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의 추정치인 β1‘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하지만, 광역시도 안에서 시군구의 이질성이 너무 크면 추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응급병상수-응급사망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관계는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점에서 우상향하는 U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부검을 잘하지 않는 편이므로(Park et al., 2019), 사망 원인으로 적절한 진단명이 부여되어 응급사망 편익에 포함되려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Dead on Arrival)하는 대신 의학적 처치가 가능한 중증도에서 응급실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병상이 늘어나 접근성이 좋아지면 중증도가 낮아져 응급사망이 감소하는 효과에 더해, 원래 응급사망이지만 진단명이 부여되지 않은 채로 사망하여 응급사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망들이 포함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또, 응급의료에 대한 조정 문제가 있다는 점(Min et al., 2023)을 고려하면, 별도의 실증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갈 수 있는 응급실의 양적 증가는 개별 의료기관의 책무성을 약화하여 비효율적인 이송을 통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의 결합은 응급의료 접근성의 개선이 응급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병상 증가로 인한 응급사망감소효과는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응급사망 증가 효과는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띨 것이며 실제로 관찰되는 효과는 이 둘을 합친 U자형 곡선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그림 1).
응급사망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모형을 구축한 분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응급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응급사망이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다고 가정하고 분할선형회귀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이후 분할모형)은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응급사망 포착 효과와 응급병상 증가로 인한 비효율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감쇄를 그대로 수용하고 변곡점 이후에는 응급사망이 증가하여 음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두 번째 모형(이후 결합모형)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망 감소 경향과 사망 포착·비효율 증가 경향의 합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U자형 그래프의 개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y=log x+ex이지만 독립변수에 이미 로그가 취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이 복잡해지고 y=log x+ex의 형태로 추정하더라도 모형의 적합도가 해석의 어려움을 감수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y=x+ex,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의 변형을 반영하면 log y=log x+x의 형태로 추정하였다. 이때 log x의 추정치를 응급사망감소 효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x의 계수에 해당하는 생존도달과 비효율 증가가 적어도 상쇄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분할모형은 기준이 되는 변곡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추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도 2]에서 관찰되는 변곡구간 안에서 응급사망 효과의 추정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골라 편익 재계산에 반영하였다. 결과의 비교를 위해 <표 4>에는 시군구 면적 1㎢당 응급병상 1개가 위치한 지점을 변곡점으로 잡아 제시하였다.5) 모형 2와 3은 거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모형 1과 2를 기준으로 응급병상수 변곡점 기준에 따른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변화를 그리면 [부도 3]과 같다. 기준점에 따른 추정치, AIC, BIC는 <부표 3>에 표기하였다. 분할모형에서 얻어진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최소치는 0.167%, 최대치는 0.200%이고, 결합모 형에서 얻어진 응급사망감소 효과는 0.208%이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모두 값이 커지기 때문에 보수적 추정을 위해 반올림 없이 셋째 자리에서 사용하였다. 다만, 보수적 추정을 하더라도 응급병상 증가에 따른 응급사망감소를 계산하기 위해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응급사망률이 감소할 것이다,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생존하여 도달하여 사망으로 추가 포착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비효율로 인한 응급사망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4
<의료부문지침>의 응급사망감소 편익 재계산
| 재분석 1 – Cutoff exp(0) | 재분석 2 – mixed model |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 모형 1 | 모형 2 | 모형 | |
| 고정효과 | ||||||
| 연도 | O | O | O | O | O | O |
| 광역시도 | O | O | O | O | ||
| log(응급병상수/㎢) | ||||||
| cutoff 이전1) | -0.236 (0.007) | -0.196 (0.007) | -0.196 (0.007) | -0.254 (0.006) | -0.208 (0.153) | -0.208 (0.007) |
| cutoff 이후2) | 0.472 (0.034) | 0.455 (0.028) | 0.455 (0.028) | 0.178 (0.009) | 0.153 (0.008) | 0.153 (0.008) |
| 기타 변수 | ||||||
| 사망자평균연령 | - | - | 0.021 (0.020) | - | - | 0.028 (0.020) |
| 상수항 | 7.106 (0.031) | 7.112 (0.042) | 5.573 (1.509) | 7.044 (0.290) | 7.061 (0.041) | 5.000 (1.465) |
| 모형 특성 | ||||||
| 관측치수 | 1557 | 1557 | 1557 | 1557 | 1557 | 1557 |
| Adjusted R2 | 0.498 | 0.676 | 0.676 | 0.547 | 0.695 | 0.695 |
| AIC | 1140.249 | 474.995 | 475.937 | 980.234 | 383.227 | 383.213 |
| BIC | 1193.754 | 614.108 | 620.401 | 1033.739 | 522.340 | 527.677 |
3) 재산정된 응급사망 편익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
지금까지 산출한 값을 활용하여 응급사망 편익을 다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울산의료원의 경제성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살피면 <표 5>와 같다.
표 5
응급사망감소 효과 변화에 따른 편익변화
| (단위: NPV–십억 원, IRR-%) | ||||||||||||||
|---|---|---|---|---|---|---|---|---|---|---|---|---|---|---|
| 응급사망의 범위 | NEDIS | 사망원인통계 | ||||||||||||
| 3대중증응급(DOA 제외) | 3대중증응급 | 전체응급 | ||||||||||||
| 사망감소 효과1) | KDI 기준 | 재추정 | KDI 기준 | 재추정 | KDI 기준 | 재추정 | ||||||||
| 최소 | 최대 | 결합 | 최소 | 최대 | 결합 | 최소 | 최대 | 결합 | ||||||
| 검토안 | B/C | 0.63 | 0.66 | 0.68 | 0.69 | 0.65 | 0.68 | 0.71 | 0.72 | 0.70 | 0.74 | 0.76 | 0.78 | |
| NPV | -220.3 | -203.0 | -187.4 | -183.7 | -208.9 | -188.2 | -169.8 | -165.4 | -178.7 | -153.7 | -139.2 | -132.5 | ||
| IRR2) | 할인율 | 1.93 | 2.17 | 2.39 | 2.44 | 2.09 | 2.38 | 2.62 | 2.68 | 2.48 | 2.79 | 2.95 | 3.04 | |
| 편익 | 59.4 | 52.3 | 46.4 | 45.1 | 54.6 | 46.7 | 40.3 | 38.8 | 43.3 | 35.1 | 30.8 | 28.9 | ||
| 비용 | -37.3 | -34.2 | -31.7 | -31.1 | -35.3 | -31.8 | -28.7 | -28.0 | -30.2 | -26.0 | -23.5 | -22.4 | ||
| 대안 | B/C | 0.65 | 0.68 | 0.70 | 0.71 | 0.67 | 0.70 | 0.74 | 0.74 | 0.72 | 0.76 | 0.79 | 0.80 | |
| NPV | -202.2 | -184.9 | -169.3 | -165.6 | -190.8 | -170.2 | -151.8 | -1473 | -160.6 | -134.0 | -121.1 | -114.5 | ||
| IRR2) | 할인율 | 2.09 | 2.34 | 2.55 | 2.61 | 2.26 | 2.54 | 2.79 | 2.85 | 2.65 | 2.97 | 3.13 | 3.22 | |
| 편익 | 54.5 | 47.6 | 42.0 | 40.6 | 49.9 | 42.2 | 36.0 | 34.6 | 38.9 | 31.0 | 26.8 | 25.0 | ||
| 비용 | -35.3 | -32.1 | -29.6 | -28.9 | -33.3 | -29.7 | -26.5 | -25.7 | -28.0 | -23.7 | -21.1 | -20.0 | ||
<울산 재조사> 보고서는 응급사망감소의 편익에 다른 편익을 더한 후 사전에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편익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새로운 추정치를 활용해서 얻어진 응급사망감소 편익을 기반으로 전체 편익을 다시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얻어진 응급사망감소 편익으로 보고서의 기존 응급사망감소 편익을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을 각 해의 전체 편익에 더해준 다음 할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편익비용비를 재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보고한 2028년의 편익이 응급 5431.5백만 원, 전체 30189.6백만 원일 때 새로 추정한 응급 편익이 6976.8백만 원이라면 차이인 1545.3백만 원을 전체 편익에 더해 2028년의 전체 편익은 31734.9백만 원인 것으로 계산했다. <울산 재조사> 보고서에서는 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인해 추가로 응급 병상 28병상이 공급되며, 이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진료권의 응급병상이 33.7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 병상 비율 증가에 따른 응급사망감소율인 0.13%를 곱하여 응급진료권의 사망률 감소치를 4.39%로 산출하였다. 울산의료원 진료권의 응급병상수는 0.13개/㎢로 응급병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사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응급병상 1개/㎢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감소 구간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논리로 응급사망감소 효과를 재추정할 수 있다. 사망 감소 효과(분할모형 최소 0.167%, 분할모형 최대 0.200%, 결합모형 0.208%)에 33.73%를 곱하면 사망 감소 효과는 각각 5.63%, 6.75%, 7.02%가 된다.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편익의 증가분에 대해서 동일한 할인을 거쳐 편익비용비 (B/C),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계산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다소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에 대해서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편익비용비가 1, 순현재가치가 0이 되기 위해 필요한 편익의 증가 비율과 비용의 감소 비율을 계산하였다. <울산 재조사> 보고서에서 주로 검토한 것은 대안으로 편익비용비는 0.65이다. 분할 모형에서 얻어진 응급병상 확대를 통한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최솟값, 최댓값, 혼합모형에서 얻어진 응급사망감소 효과를 각각 대입하여 재추정해 보면 B/C가 0.68~0.71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3대 중증응급 사망에서 도착 전 사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B/C가 0.02 정도 증가하고, 응급사망감소 효과 재추정치를 사용하면 B/C가 0.70~0.74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3대 중증응급이 아닌 28대 중증응급 전체를 편익에 반영하면 KDI에서 추정한 응급사망감소 효과 기준으로 B/C가 0.72, 재추정 효과 기준으로는 B/C가 0.76~0.80의 값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재산정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이용한 AHP 분석
앞서 산출한 값을 활용하여 응급사망 편익을 다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울산의료원의 편익비용비를 다시 추정하였다. 재추정된 편익비용비를 사용하여 AHP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평가자와 무관하게 산출된 값을 표준점수화하여 사용하며,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은 경우 log(B/C) * 5.11532 – 1의 식으로 표준점수를 계산한다(이호준 외, 2012, p. 168). 따라서 편익비용비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사업 시행 판단확률이 증가하는 정도는 5.11532 * (log(B/C) - log 0.65)에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곱한 것이 된다. 응급사망 편익 재산정에 따른 편익비용비는 0.68-~0.80 사이에 분포하므로 편익비용비가 0.70, 0.75, 0.80인 세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AHP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고, <울산 재조사> 보고서 <표 X-6>에 따라 시행:미시행의 구성과 종합평점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였다(한금용 외, 2023, p. 463). 편익비용비가 기존 추정인 0.65에서 0.70, 0.75, 0.80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행:비시행 평가는 5:3, 7:1, 8:0으로 개선되었고, 모든 편익비용비 시나리오에서 종합평점이 0.517을 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AHP 분석의 결론이 ‘약간 신중’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바뀌는 지점은 편익비용비 0.68로 3대 중증응급사망이 아닌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기만 해도 응급병상 증가에 따른 한계 응급사망감소 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무관하게 AHP 분석의 결론이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표 6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평가 결과 및 B/C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
| 평가자 | 경제성 평가 가중치 | 평가 결과 (B/C 0.65) | B/C | ||
|---|---|---|---|---|---|
| 0.70 | 0.75 | 0.80 | |||
| 1 | 0.300 | 0.450 | 0.499 | 0.545 | 0.588 |
| 2 | 0.300 | 0.473 | 0.522 | 0.568 | 0.611 |
| 3 | 0.370 | 0.531 | 0.592 | 0.649 | 0.702 |
| 4 | 0.300 | 0.509 | 0.558 | 0.604 | 0.647 |
| 5 | 0.350 | 0.439 | 0.497 | 0.550 | 0.600 |
| 6 | 0.300 | 0.470 | 0.519 | 0.565 | 0.608 |
| 7 | 0.300 | 0.400 | 0.449 | 0.495 | 0.538 |
| 8 | 0.350 | 0.556 | 0.614 | 0.667 | 0.71 |
| 종합 | 0.321 | 0.486 | 0.539 | 0.588 | 0.634 |
| 결론 | 시행:미시행 | 1:7 | 5:3 | 7:1 | 8:0 |
| 종합평점 | 2구간 | 4구간 | 4구간 | 4구간 | |
| 결론 | 약간 신중 | 타당성 있음 | 타당성 있음 | 타당성 있음 | |
5) 광주의료원 사례에 대한 적용
1)~4)에서 사용한 재분석 방식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 재조사>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에도 적용해 보았다(정용관 외, 2023).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사용한 응급의료통계연보의 사망자 수를 사망원인통계에서의 3대 중증응급질환과 28개 중증응급질환 사망자 수로 대체했을 때 얻어지는 편익을 산정하였다. 응급의료통계연보에서의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통계에서의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자 수 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결과와는 달리 광주의료원 사례의 경우 두 숫자 간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응급의료통계연보 기준 39.2명, 사망원인통계 기준 91.4명). 광주광역시의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이 28대 중증응급질환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69%로 광주 광역시의료원이 담당하는 진료권(서구, 광산구)에서도 동일한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53.1명이 되어 응급의 료통계연보 기준의 수치에 비해 3.9배나 많다.
응급병상 증가에 따른 응급사망감소 효과는 기존 분석의 수치(병상 1% 증가당 0.13% 감소)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응급의료통계연보 기준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 사망원인통계 기준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 사망원인통계 기준 28개 중증응급질환 사망의 세 가지를 응급사망감소 편익 산정 과정에 투입하여 편익비용비를 다시 계산하였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검토안 0.63, 대안 0.65의 편익비용비를 보이고 있는데, 사망원인통계로 자료원을 변경하는 경우 검토안의 편익비용비는 0.81, 대안은 0.84가 된다. 응급사망감소 편익의 범위를 28개 중증응급질환까지 넓히면 검토안 편익비용비는 0.99, 대안은 1.02가 되어 편익비용비의 큰 개선이 나타난다.
AHP 분석은 기존 분석의 편익비용비인 0.65에서는 시행:비시행 평가 3:5, 종합평점 0.457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하지만, 편익비용비가 0.68이 되면 시행:비시행 평가는 4:4, 종합평점 0.491이 되어 신중으로, 0.69에서는 시행:비시행 평가 5:3, 종합평점 0.502로 약간 신중이 된다. 편익비용비가 0.7043보다 커지게 되면 시행:비시행 평가 5:3, 종합평점 0.517로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이 바뀌게 되고, 재분석에서 얻어진 편익비용비인 0.8~1.0에서는 시행:비시행 평가 8:0, 종합평점은 0.564~0.780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게 된다. 울산의료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주의료원 역시 편익비용비가 약간만 개선되어도 AHP 분석의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민감도분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의 결론이 강건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새로 산출한 4개의 편익비용비를 사용해 AHP 분석을 다시 시행해 보면 모든 경우에서 시행:비시행 평가는 8:0이고 종합평점은 각각 0.622, 0.649, 0.772, 0.794로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Ⅳ. 결론 및 고찰
1. 재분석 결과의 요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응급의료 편익 산정
이 연구에서는 <의료지침>과 <울산 재조사> 보고서에서 출발하여 보건의료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편익을 재계산한 다음 그에 따라 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범유행과 같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병원이 수행해 온, 또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편익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편익 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응급사망감소 편익이다. 여기에는 중증 응급사망의 범위를 3대 중증응급으로 한정하여 양적으로 좁게 설정하였다는 점, 응급병상 신설로 인한 응급사망감소 효과를 질적으로 과소평가하였다는 점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울산 재조사> 보고서에서 사용한 응급사망의 범위는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2/3 수준이고, 응급사망감소 효과는 추정 방식에 따라 63~78% 정도 수준으로 과소추정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울산의료원 사업의 편익비용비를 다시 계산하면 대안 기준 가장 보수적인 모형(응급사망을 DOA를 제외한 3대 중증응급으로 한정하고, 응급사망감소 효과만 추정치의 최솟값으로 변경)에서 0.68, 가장 편익이 커지는 모형(응급사망의 범위를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두고, 응급사망감소 효과 역시 추정치의 최댓값으로 활용)에서 0.80이 된다. 이 값을 활용하여 다시 AHP 분석을 해보면 편익비용비가 0.68이 되는 지점에서 분석의 결론이 ‘약간 신중’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바뀐다. 응급사망의 범위를 전체 중증응급사망으로 넓히기만 해도 편익비용비는 0.72가 되고 이 값에서 AHP 종합평점은 0.559, 시행: 미시행은 7:1이 되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재분석의 결과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가 0.05 정도 작게 추정되는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편익비용비가 0.70이 되지 않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없고(정동호, 김의준, 2020), 이 문제로 인해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결론이 ‘타당성 있음’에서 ‘약간 신중’으로 바뀐 탓에 울산의료원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면 작지만 치명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중증응급사망의 범위를 3대중증응급질환에서 28개 중증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만 넓혀도 울산의료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3대중증응급질환에 비해 나머지 25개 중증응급 질환의 치료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더 시간민감성이 크다면 논문의 주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25개 중증응급질환 중 대동맥박리 정도를 제외하면 긴급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이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제공된 내과적,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많다는 점에서 응급사망 편익 계산에 이들 질환을 포함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또, 공공병원을 새로 짓더라도 이들이 중증응급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진료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일단 지역적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능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만 있다면 응급사망 편익 사망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광주의료원 사례가 보여주듯 특별시‧광역시의 고유한 사정과 공공병원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응급사망을 산정하는 자료원과 범위가 달라져야 하고, 이에 따라 응급사망감소로 인한 기대편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응급병상 증가로 인한 응급사망감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여 편익 계산에 반영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산출에는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응급사망률이 감소할 것이다,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생존하여 도달하여 사망으로 추가 포착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비효율로 인한 응급사망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사용되었다. 각 가정은 이론적으로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모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영향 요인의 존재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응급환자진료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2.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조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이루어진 재조사 역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부적정 판단’을 받은 사업에 대한 재조사가 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하듯(강기홍, 2019),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재조사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의료원 사례는 재조사가 사업 그 자체를 폐기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재정사업에서 정치적 판단없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하게 휘둘려서는 곤란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보건의료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적으로 강건하게 개선해 나가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보건의료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병원 설립 문제와 맞물려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은 편이다. 그러나 관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건의료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측과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측 모두에 나름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수행하는 측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문제는 보건의료를 체계 관점에서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조사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보건의료체계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회계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이유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다루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서 감가상각과 할인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미 결정된 것에 가까운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건의료에서 문제가 되는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유행, 기후위기 등은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체계가 예정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미래의 가능한 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사전에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출근 시간을 앞당 기고, 운전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스노타이어나 체인 같은 차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챙기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보건의료체계도 더 긴 시간적 범위를 다룰 뿐 같은 방식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김진환, 2023). 회계적 관점에서 시간을 평면적으로 이해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가정하는 지금의 편익 산정 방식으로는 감염병 대응과 같은 편익을 포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 결과,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유행, 기후 위기 등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거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의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는 <의료지침>에 있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보여주듯 보건의료 필요에 대한 다소 잘못된 이해가 있고, 그런 이해가 체계로서의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결합하면서 바람직한 공공병원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다(이호준 외, 2012, p. 14; 김민호 외, 2022, p. 24).
주: 인용구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제시함. 굵게 표기된 부분은 저자 강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역시 잔여적, 보완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공병원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기능 중 일부 기능의 우선성(primacy)이지, 다른 기능은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기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또, 지역의 의료 필요는 충족된 것, 충족되지 않은 것에 더해 아직 인지되지 않아 수요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박유경 외, 2020). 최선의 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의료 전문가에게 상당 부분 독점되어 있고, 환자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료 필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의료 필요를 인지하는 과정 자체에 일종의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 혹은 인식 론적 주변화(epistemic marginalizaton)가 있는 상태에서, 드러난 수요를 중심으로 의료를 다루는 방식은 지역 간 불평등을 승인, 강화할 위험이 있다(Abimbola et al., 2024). 지역에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점점 더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의 중요성을 낮추면서도 조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 혹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전체 면제 대신 경제성 조사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병원 자체도 개별 기능들의 단순한 결합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일관성을 가지는 체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배후 혹은 상시 기능들이 존재한다.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전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유행이 없는 때도 의료진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안전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인공호흡기, ECMO 등을 이용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재난 시기에 중환자 치료를 맡을 수 있다. 이는 평시 기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응급한 환자를 받아주는 관문으로 응급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공공병원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자살 시도자 등 중증응급사망감소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는 시간 민감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용한 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역량이 같은 병원 안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급성기 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병원은 급성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공병원 신설로 인한 응급병상 확대의 중증응 급사망감소 편익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일관성을 다소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비타당성조사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공공병원 신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상(像)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누락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체계 수준의 편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비판을 내어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안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데, 잔여적 기능에서 얻어지는 편익을 제외한 다른 편익을 공공병원 설립의 편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김민호 외(2022) 나 이호준 외(2012)의 지적과 연결된다.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가 되는 영역의 편익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편 방안과 예비타당성 통과 전략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논의가 보다 깊어져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공공병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비효율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다룬 울산의료원은 배후 진료권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단일 진료권에 가깝다. 반면, 부산처럼 산이 많아 도로 거리 기준 진료권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면서 인구 대비 의료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 인구가 적고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 군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편익 산정이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편익 산정과 면제 필요성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김태일, 2019).
또, 적자가 공공성에서 비롯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과도하게 부족한 공공병원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상황은 향후 공공병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박민정, 임성실, 2021). 마지막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공병원이 민간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우명동, 2022). 설립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잔여적 기능만을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 ‘잔여적’이라고 여겨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기존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고, 유능한 경영자가 오더라도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하는 더 너르고, 긴 호흡에서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전히 경제성 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을 결정하는 면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상향이 지역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정동호, 김의준, 2020), 여러 영역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고 그에 대응해서 제도를 개선해 온 것도 사실이다. 경제성평가 가중치 역시 0.300~0.450 사이를 부여할 수 있어 평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 <울산 재조사> 보고서의 AHP 분석에 참여한 8명의 평가자 중 5명이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인 0.300 을, 2명이 0.350을, 1명이 0.370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평가자들 역시 울산의료원 설립을 경제성 분석만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보수성이 대안적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한계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전망 아래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정치적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공적자원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일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예외적, 일시적 접근인 ‘면제’를 주요 전략으로 택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과정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편향이 무엇인지 등 기존의 정책 도구가 가지는 내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이를 토대로 한 방법론적 개선을 위한 더 너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교적 초기에 검토한 이호준 외(2012) 역시 구체적인 편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보건의료에 특수한 편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사회기반시설과는 다른 고유한 편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학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정철 외, 2021; 박승준, 2022). 보건의료의 고유한 편익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그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연구자들이 노력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좋은 공공병원에 대한 더 너른 합의와, 더 정교한 상상력을 갖추고, 다소 단선적인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넘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록
부도 1
응급병상 증가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분포 변화
주: (a) 응급병상이 증가하기 전 환자의 분포 중증도가 매우 높은 사람은 응급실에 도달하여 진단명을 부여받기 전에 사망하고, 병원에 도달한 사람들은 진단명을 부여받고 중등도에 따라 나눠진다.
(b) 응급병상이 증가한 후 환자의 분포 응급병상이 증가하면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환자의 분포가 왼쪽으로 이동하여 경증환자가 늘어나고 중증환자가 줄어든다. 두 번째로 응급실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의 일부가 응급실에 도달하여 진단명을 부여받은 후 사망하게 되어 중증 환자가 다소 늘어난다. 따라서 응급병상 증가는 도달 전 사망 환자의 일부를 생존하게 하며,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환자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편익을 산출한다.
부표 1.
28개 중증응급질환 진단코드
| 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코드 | 구분 | 3대 중증응급 |
|---|---|---|---|---|---|
| 1 | 심근경색증 | I21 | 2군 | O | |
| 2 | 뇌경색증 | I63-4 | 2군 | O | |
| 3 | 뇌실질출혈 | I61-2 | 1군 | O | |
| 4 | 거미막하출혈 | I60 | 1군 | O | |
| 5 | 중증외상 | 두부손상 | S0610-1, S0650-1, S0660-1, S0670-1, S068-1, S0200-1, S0210-1, S0620-1, S069-1 | 1군 | O |
| 두부손상 | S064~S0641 | 2군 | O | ||
| 경부손상 | S150 | 1군 | O | ||
| 흉부손상 | S250, S2600-1, S2680-1, S2690-1, S2710-1, S2720-1, S280, S2730-1 | 1군 | O | ||
| 골반골절 | S32820-91 | 1군 | O | ||
| 복부손상 | S351-5, S357, S359, S36100-12, S3670-1, S3680-1, S3770-1, S396 | 1군 | O | ||
| 복부손상 | S3640-1, S3650-1 | 2군 | O | ||
| 하지손상 | T0250-1, T790-1 | 1군 | O | ||
| - | ICISS < 0.90 | 2군 | O | ||
| 질식/익수 | T71, T751 | 2군 | O | ||
| 6 | 대동맥박리 | I7101-9, I7110-9, I713, I715, I718 | 1군 | ||
| 7 | 담낭담관질환 | K8000-11, K8030-41, K8051, K810, K819, K830-1 | 2군 | ||
| 8 | 외과계질환(장중첩/폐색 별도) | K352-3, K631, K650-9, K661 | 3군 | ||
| 9 | 위장관출혈/이물질 | I850, I8640, I983, K920-2, K226, K2500, K2540, K2501, K2521, K2541, K2561, K260, K262, K264, K266, T181 | 2군 | ||
| 10 | 기관지출혈/이물질 | R042, R048-9, T174-5, T178-9 | 2군 | ||
| 11 | 중독(CO 포함) | T360∼T659 | 3군 | ||
| 12 | 주산기질환 | O000-9, O140-59, O4200-1, O4209-11, O4219-21, O4229, O4290-1, O4299, O450-9, O6000-39, O800-9, O820-9, O720-3, O622 | 3군 | ||
| 13 | 조산아/저체중아 | P0700-39, P220-9, P240-9, P360-9, P520-9, P590-9 | 3군 | ||
| 14 | 중증화상 | T313-9, T203, T207, T213, T217 | 1군 | ||
| 15 | 간질지속상태 | G410-9 | 2군 | ||
| 16 | 중증감염 | A830-70, A872, G0-7, A021, A227, A241, A267, A400-9, A410-4, A419, A427, B007, B377, A418, R651, A750-9, A985, A9380, A9388, B334, A770-99 | 3군 | ||
| 17 | 당뇨성혼수 | E1000-018, E1100-118, E1300-18, E1400-18, E160, E162, E15, E1363, E1063, E1163, E1463, E875 | 2군 | ||
| 18 | 폐색전/DVT | I260, I269, I802 | 1군 | ||
| 19 | 부정맥 | I441-2, I450-9, I472, I480-9, I490, I495, I4981-8, I499 | 2군 | ||
| 20 | ARDS/폐부종 | J80-1, J85-6, J960, J969, I501, J0510-1 | 1군 | ||
| 21 | DIC | D65 | 1군 | ||
| 22 | 장중첩/폐색 | K561-3, K565-6 | 3군 | ||
| 23 | 사지절단 | S480-9, S580-9, S680-9, S780-9, S880-9, S980-4, T050-9, T060-8, T116, T136 | 3군 | ||
| 24 | 급성신부전 | N170-9, E1128 | 1군 | ||
| 25 | 안과적 응급 | H3300-9, H331-5, H340-9, H400, H4010-9, H402-6, H408-9, H420, H428 | 3군 | ||
| 26 | 소생술후 상태 | I460-9 | 1군 | ||
| 27 | 비뇨기과 응급 | N44, N4500-2, N4590-2 | 3군 | ||
| 28 | 쇼크 | T794, T886, T780, T805, T782, R570-2 | 1군 | ||
출처: “2022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2023, p. 327.
부표 2
<의료지침>의 응급사망감소 편익 분석 재현
| 기존 분석 | 재현 분석 |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 고정효과 | ||||||
| 연도 | O | O | O | O | O | O |
| 광역시도 | O | O | O | O | ||
| log(응급병상수/㎢) | ||||||
| 기본 모형 | -0.163 (0.005) | -0.129 (0.006) | -0.129 (0.006) | -0.160 (0.005) | -0.129 (0.006) | -0.129 (0.006) |
| 결과변수 lag | - | - | - | -0.160 (0.005) | -0.129 (0.007) | -0.129 (0.007) |
| 독립변수 lag | - | - | - | -0.158 (0.005) | -0.127 (0.007) | -0.127 (0.007) |
| 기타 변수 | ||||||
| 사망자 평균연령 | - | - | 4.405 (1.181) | - | - | 0.025 (0.022) |
| 상수항 | 2.160 (0.026) | 2.134 (0.042) | -16.736 (5.061) | 7.373 (0.026) | 7.372 (0.042) | 5.539 (1.629) |
| 모형 특성 | ||||||
| 관측치수 | 1,557 | 1,557 | 1,557 | 1,557 | 1,557 | 1,557 |
| Adjusted R2 | 0.455 | 0.624 | 0.627 | 0.435 | 0.622 | 0.622 |
| AIC | - | - | - | 1,325.623 | 713.591 | 714.301 |
| BIC | - | - | - | 1,373.778 | 847.353 | 853.418 |
부도 3
응급병상수 변곡점 기준에 따른 응급사망감소 효과의 변화
주: 1) 연한 파란색으로 표기된 점들은 모형 1에서 얻어진 추정치를, 검은색으로 표기된 점들은 모형 2에서 얻어진 추정치를 뜻한다.
2) ◉으로 표기된 점은 응급사망감소 효과가 가장 큰 기준점, ●은 모형의 AIC, BIC가 가장 작아 적합도가 가장 높은 기준점.
부표 3
응급병상의 기준점 설정에 따른 응급사망효과의 변화
| 기준점 log(응급병상/㎢)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
| 추정치 | AIC | BIC | 추정치 | AIC | BIC | 추정치 | AIC | BIC | |
| -1.50 | -0.191 | 1315.703 | 1369.208 | -0.169 | 677.896 | 817.009 | -0.169 | 678.679 | 823.142 |
| -1.40 | -0.204 | 1303.023 | 1356.528 | -0.181 | 650.311 | 789.424 | -0.181 | 650.975 | 795.438 |
| -1.30 | -0.208 | 1299.059 | 1352.564 | -0.183 | 646.452 | 785.566 | -0.183 | 647.085 | 791.548 |
| -1.20 | -0.216 | 1286.567 | 1340.072 | -0.187 | 637.355 | 776.468 | -0.187 | 638.107 | 782.571 |
| -1.10 | -0.214 | 1288.105 | 1341.610 | -0.189 | 625.819 | 764.933 | -0.189 | 626.617 | 771.080 |
| -1.00 | -0.213 | 1289.799 | 1343.304 | -0.186 | 630.745 | 769.859 | -0.186 | 631.334 | 775.798 |
| -0.90 | -0.215 | 1286.078 | 1339.583 | -0.186 | 627.864 | 766.977 | -0.186 | 628.404 | 772.868 |
| -0.80 | -0.225 | 1267.255 | 1320.760 | -0.197 | 592.035 | 731.148 | -0.197 | 592.868 | 737.332 |
| -0.70 | -0.225 | 1265.529 | 1319.034 | -0.199 | 584.302 | 723.415 | -0.199 | 585.164 | 729.628 |
| -0.60 | -0.229 | 1254.125 | 1307.630 | -0.200 | 575.979 | 715.092 | -0.200 | 576.322 | 720.786 |
| -0.50 | -0.236 | 1232.856 | 1286.361 | -0.200 | 564.688 | 703.801 | -0.200 | 565.196 | 709.660 |
| -0.40 | -0.230 | 1238.620 | 1292.125 | -0.198 | 570.514 | 709.628 | -0.198 | 570.796 | 715.260 |
| -0.30 | -0.234 | 1218.382 | 1271.888 | -0.194 | 569.809 | 708.922 | -0.194 | 570.208 | 714.672 |
| -0.20 | -0.231 | 1212.727 | 1266.232 | -0.193 | 556.529 | 695.642 | -0.193 | 556.335 | 700.799 |
| -0.10 | -0.231 | 1191.384 | 1244.889 | -0.193 | 521.085 | 660.198 | -0.193 | 522.091 | 666.555 |
| 0 | -0.236 | 1140.249 | 1193.754 | -0.196 | 474.995 | 614.108 | -0.196 | 475.937 | 620.401 |
| 0.10 | -0.236 | 1117.755 | 1171.260 | -0.195 | 465.965 | 605.078 | -0.195 | 466.176 | 610.640 |
| 0.20 | -0.229 | 1140.672 | 1194.177 | -0.191 | 473.656 | 612.769 | -0.191 | 473.654 | 618.118 |
| 0.30 | -0.224 | 1138.822 | 1192.327 | -0.183 | 491.920 | 631.034 | -0.183 | 492.469 | 636.933 |
| 0.40 | -0.216 | 1142.220 | 1195.725 | -0.170 | 556.254 | 695.367 | -0.170 | 557.078 | 701.542 |
| 0.50 | -0.212 | 1140.346 | 1193.852 | -0.167 | 574.086 | 713.199 | -0.167 | 575.164 | 719.628 |
Notes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344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Q1Y1S1T5F1F7Y1K5U2A4J7Q1E3
[그림 1]은 <의료지침> p. 67의 [그림 Ⅲ-2]를 개념도로 그린 것이다. 실제 재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로 시군구별 log(응급병상수/㎢)와 log(사망률)의 관계를 그린 곡선은 [부도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면적 1㎢당 응급병상이 1개보다 많은 지역은 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하면 경기 부천시(2.39), 의정부시(1.77), 안양시(1.35), 성남시(1.33), 수원시(1.29), 군포시(1.29), 전남 목포시(1.76)뿐이다. 의료원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울산과 광주의 구 중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은 울산 중구(1.41), 동구(1.03), 광주 동구(1.70), 서구(1.36)의 네 곳뿐이다. 울산 중구와 동구는 울산의료원의 진료권에 포함되어 있고 면적 1㎢당 응급병상이 1개보다 많지만, 울산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1㎢당 응급병상은 0.16개에 불과하고 설립 예정지역이 울산 북구(0.13)라는 점에서 추정에 큰 무리가 없다.
References
. (2020. 12. 10.).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https://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brdclscd=01
. (2023. 12. 18). 2022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https://www.e-gen.or.kr/nemc/statistics_annual_report.do?brdclscd=03
. (2020. 6.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허상이다 -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 부치는 글.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710529
. (2020. 11. 20). ‘지금 아니면 언제?’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 확충 요구 거세.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82
. (2024. 4. 4). 경제성 낮다며 공공의료 후퇴시키는 정부 [왜냐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5307.html
. (2024. 1. 21). 울산‧광주 등 공공의료원 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229
. (2020. 11. 3). 코로나 겪고도 공공병원 신·증축예산 '0원'이라니... 충격.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592
. (2023. 6. 14). [단독] 간병비 부담 던다는 '간호간병병동'…중증환자는 13%뿐.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734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01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05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9-19

- 885Download
- 2696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