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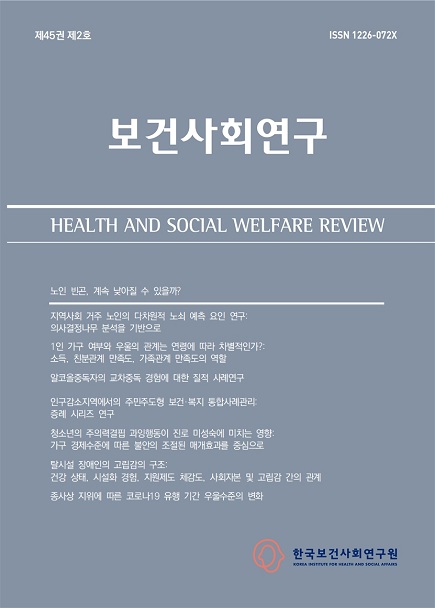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지방 거주 청년의 인구 이동 유형에 따른 혼인행태 분석: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를 중심으로
Intercity Migration and Marriage Behavior Among Young Adults: Cheongju, Cheonan, and Jeonju in Focus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청년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유입, 정착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혼인이 지역 정착의 주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주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이동 이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혼인 이행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청주시와 전주시는 계속 거주 집단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천안시는 타 시도 출신 청년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3개 도시 모두 최근 5년 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층이 지역 내 계속 거주 청년층보다 혼인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지방 도시 간에도 경제·문화적 여건에 따라 청년층의 정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기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지원이, 천안시는 청년 유입 촉진과 장기 정착 전략이, 전주시는 청년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Abstract
The trend of young people moving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 the capital region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Comparing intercity movement patterns and projecting future trends is crucial for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non-capital provinces and shaping future policy direc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movement patterns and marriage behavior among young adults in Cheongju, Cheonan, and Jeonju.
Using data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is study focused on individuals aged 19 to 34. A total of 7,891 complete cases without missing value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Cheongju and Jeonju showed similar patterns of regional movement with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continuing residents, Cheonan had a higher rate of inflow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Second, the likelihood of marriage wa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and increased with age. Regional movement patterns were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all three cities—Cheongju, Cheonan, and Jeonju —recent in-movers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marry than long-term resi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job support measures and marriage promotion policies to help increase the settlement rates of young people moving into non-capital provinces. Additional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that support young adults who have resided in these areas for extended periods.
초록
지방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사회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도별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도시 내 이동 현황을 비교하고 장래 추계를 예측하는 것은 지방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도시 중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3개 지역의 인구 이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혼인행태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데이터로, 만 19~34세 청년을 선별, 이 중 결측이 없는 사례 7,891명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주시와 전주시의 지역이동 경향이 유사한 가운데 2개 지역에서는 계속 정주 집단이, 천안시는 타 시도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성 대비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자 대비 일시 휴직 상태일 때,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대비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도 혼인 승산이 높았다. 지역이동 경로도 유의미했다.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모두 비교적 최근 현 거주지로 유입된 청년집단(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이 계속 거주 집단(현 거주지 →현 거주지→현 거주지)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 유입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및 결혼 장려 정책, 계속 거주 청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Ⅰ. 서론
최근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거주지 선택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청년인구의 유입은 도시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이들은 경제활동과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 구조를 개선한다(UN, 2018). 문제는 이동의 도착지가 일부 특정 도시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입된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지 권역을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만 19~34세) 비중은 수도권이 10.3%(462천 명), 중부권이 34.3%(418천 명), 호남권이 35.5%(427천 명), 영남권이 25.6%(675천 명)이다(통계청, 2023).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생지 권역을 이동한 청년세대 비중이 작다. 2010년 대비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 비율이 중부권(9.5%p)과 호남권(9.8%p), 영남권(0.4%p)에서는 모두 감소하고, 수도권(0.7%p)에서만 증가했다고는 하나, 해당 상승분은 세 개 권역 내 하락분을 상쇄할 수 없을 만큼 미비하다. 실제로, 출생지 권역을 떠나 이동한 중부권(83.1%)과 호남권(74.5%), 영남권(75.9%)의 청년인구 중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했고, 그 결과 청년세대의 과반수 이상인 53.8%(5,491천 명, 2020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상황에 이르렀다(통계청, 2023). 이에 반해 청년인구의 절대적인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6월 기준, 청년세대 인구(9,968천 명) 비중은 총인구(51,271천 명)의 19.4%에 불과하다(통계청, 2024a). 과거 1990년 31.9%(13,849천 명)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기준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b). 청년인구는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지방의 청년들까지 수도권으로 밀집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청년인구의 이동은 단순한 인구 변화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청년층의 유입은 주거 안정성, 취업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결혼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직장, 거주지, 사회적 지위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는데, 이러한 도시 내 청년층의 결혼 비율 변화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문제는 과밀화이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층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 직면하고, 직장에서의 성과와 커리어에 집중하다 보면 결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다.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임대료로 인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높은 생활비 등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해 결혼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해당 요인들은 결혼뿐 아니라 출산율 감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수도권 과밀화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지방은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청년인구가 이탈하는 지역에서는 혼인율 하락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는 주로 경제적 기회 부족과 직결된다. 지방에서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부족해지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광역권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지역 내 결혼이 가능한 상대가 줄어드는 상황을 연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일자리 산업이 지배적인 지역일수록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에 남아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혼인율이 감소하면 출생률도 함께 낮아져 지역 내 인구는 결국 줄어들게 되며, 이는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한다. 줄어든 청년가구 수는 지방의 노동 및 소비시장을 약화시키고, 지역 투자 등의 축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권오규, 마강래, 2012; 김가현, 김근태, 2023).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역으로 지방 주요 도시에 전입하는 집단의 특성이다. 지방에서 이탈하지 않는 계속 거주 집단과 신규로 유입되는 집단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현 거주지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강점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보통 결혼은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기회, 교육 인프라, 주거 조건 등의 요인들이 개인의 결혼 결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향후 지역 내 정착률과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롭게 이주한 청년층과 지역 내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청년층 간의 혼인율 차이는 중요한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유입 청년층이 결혼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잘 통합되는지, 아니면 기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차이로 결혼을 유보하는 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내 인구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청년층의 유입과 결혼 확률 간의 관계, 특히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간의 결혼 확률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청년층의 이동과 경제적 지표,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결혼이라는 특정 사회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도시 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역이동 이력을 분석해 집단을 유형화하고, 혼인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채 인구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를 산출해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현재 청주시는 충청북도 내 최다(7위), 천안시는 충청남도 내 최다(10위),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다(12위) 인구를 보유한 도별 핵심 도시이다. 세 도시는 모두 지방 중추 도시로서 청년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구조, 교육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천안시는 최근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 정주 인구 7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고 대학이 많아 청년층 비율이 높은 편이나,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식의 인구 이동이 빈번한 편이다. 청주시는 정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립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전체적인 인구는 천안보다 많지만, 인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전주시는 두 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정주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산업구조의 한계, 교육과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출향 행렬이 이어지고,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지방 도시 내에서도 청년층의 유입·유출 패턴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도시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청년인구의 정착과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인구 문제와 청년층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중점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3개 도시에서의 청년인구 유입 특성을 분석하고, 새롭게 현 거주지로 유입된 집단과 계속 거주하고 있던 집단 간의 결혼 확률 차이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년인구의 이동 패턴과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내에서 결혼하는 집단의 비율과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 이동 관련 이론적 접근
가. 청년층의 지역이동
다양한 이론들은 인구 이동의 동기, 원인, 그리고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푸시-풀 이론(Push-Pull Theory)은 인구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접근 방식이다. 에버렛 리(Everett S. Lee)는 1966년에 발표한 "A Theory of Migration"이라는 논문에서 이 이론의 기초를 정립했다. 푸시-풀 이론의 기본 개념은 에버렛 리의 이론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지만, 그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학문적 정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Ojiaku et al., 2018; Urbański, 2022).
기본적으로 이론은 사람들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푸시 요인(Push factors)과 풀 요인(Pull factors)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간단히 말해 푸시 요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풀 요인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을 뜻한다. 전자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거주 환경에서의 불만족, 삶의 어려움,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 실업, 낮은 임금, 지역 내 경제 성장의 둔화,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의 경제적 요인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아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강화된다. 또한 교육 기회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주거 환경의 악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박해, 인권 침해, 차별 등의 정치적 요인, 자연재해, 기후 변화, 오염 등의 환경적 요인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풀 요인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것들이다. 주로 이동은 새로운 지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 즉 더 많은 취업 기회, 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이 있다. 이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 개발 기회가 있는 도시로 청년들이 밀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더 나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의 개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기회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요 유입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더 나은 법적 보호,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인권 보장 등의 정치적 요인과 자연경관, 쾌적한 기후 등의 환경적 요인들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인구 이동은 푸시 요인과 풀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 특정 지역의 푸시 요인이 커질수록 그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커지고, 동시에 다른 지역의 풀 요인이 강력할수록 그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요인들에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조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동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요소들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 청년이 지방에서 실업 문제(푸시 요인)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도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 기회(풀 요인)가 있으면 그 청년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푸시-풀 이론은 각 지역의 문제와 기회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Parkins, 2010; Parkes, 2022).
한편, 지역 간 이동은 이동의 동기와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인구이동은 사망이나 출생 등 다른 인구학적 행동들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상림, 2009, p. 43). 물론 어떠한 사람은 거주지의 변화 없이 자신이 출생한 곳에서 평생 동안 머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며, 이후에도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계속하거나 혹은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이상림, 2009, p. 44). 이에 이동은 생애 ‘최초이동’(primary migration)과 ‘반복이동’(repeat mi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이동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의 ‘계속이동’(onward migration)과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으로 구분된다(이상림, 2009, p. 4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초이동은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과 연계되며 낮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되는 반면, 계속이동은 보다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고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귀환이동의 경우 지난 이동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림, 2009; 김재홍, 도수관, 2020).
특히 청년층의 이동 여부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동을 선택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각각 다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푸시-풀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 단계, 가족 관계, 사회적 연결망 등에 의해 결정된다(Chen, 2016; Khalid et al., 2021). 지역 미이동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시하거나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고용 조건에 만족할 때,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사 비용, 새로운 주거비 등)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미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었거나,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강할 때, 혹은 이동 후의 삶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동을 꺼릴 확률이 높다. 반면, 이동하는 청년은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대학교 진학이나 대학원 교육, 직업훈련 등의 교육 기회를 찾기 위해 상위 대학과 취업 기회가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최초이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자신을 리셋하거나,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도 이동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동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는 청년들은 각자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의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경제적 현실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정책 설계 시, 이동하는 청년들과 정주를 선택한 청년들의 욕구를 각각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나. 경제적 안정성과 혼인, 지역 정착 관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혼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나, 이 중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과 지역 정착 간의 상관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Urbański, 2022). 이들에게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결혼 결정을 촉진하는 필수조건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으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며, 가정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결혼 생활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할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ucher et al., 2017). 안정된 거주 환경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직업, 소득, 주거 비용 등에서 안정감을 주어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Mohamed, 2020; De Haas, 2021).
결혼과 지역 정착률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성, 가족 형성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힌 다수의 연구들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자녀 교육, 지역사회 참여, 생활 안정성과 같은 요소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은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부부가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지역사회에 더 오래 남아 있는 경향을 보였다(Bucher et al., 2017; De Haas, 2021). 여기서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결혼 후 부부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강한 사회적 지원망을 형성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이사나 이동에 대한 저항감을 줄인다(Jang, 2014; Bucher et al., 2017).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과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은 결혼 후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에 대한 정착 의사를 강화한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 혼인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정착 확률을 높이는 연쇄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요소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청년층의 인구 이동은 경제적 요인, 교육 기회,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다. 현재, 청년들은 더 나은 교육 및 취업 기회,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해 지방의 경제적 침체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 고령화 심화, 주거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심각성에 근거해, 최근 청년층의 인구 이동 현황과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청년층의 인구 이동 요인, 목적지 선택, 이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탐색하는 데 주력한다.
인구 이동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들은 경제적 상황과 생활환경 및 주거 조건, 교육 기회, 지역 내 청년정책 수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층 유인 요인들을 찾고 있다. 청년층은 취업 기회와 소득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고용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주된 경향을 보이며, 해당 지역 내에서 고용이 안정될수록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엄창옥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의 안정성과 정착 가능성은 비례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의사가 1단위 증가하면 지역 정착 가능성은 5.76배 증가했다. 직장이 안정되면 정착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을 이탈할 확률이 높아졌다. 김화연, 이대응(2022)의 연구와 최선, 이정은(2022)의 연구도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강원도 거주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정주 의사가 2.85배 증가했음을 밝혔고, 후자 역시 광주시 거주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해 정착한 경우, 이주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청년층에게 경제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대구 사회조사를 활용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별 계속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이창관, 박선주(202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여부는 오로지 청년층에게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쳐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확보가 중요한 정주 여건임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임태경(2023)은 청년층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20대는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미 취업했을 확률이 높은 30대는 1인당 급여액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순유입이 증대되는 것을 밝혔다.
이 중 상당수의 연구는 청년의 지역 정착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여건과 함께 혼인을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엄창옥 외(2018) 연구에서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지역 정착 가능성이 3.10배 증가했고, 반면에 출향한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결혼하면 귀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김화연, 이대응(2022)의 연구 역시 기혼일 때의 정주의사 확률이 10.67배 높아졌음을 확인했으며, 이창관, 박선주(2024)의 연구도 배우자 유무가 계속 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증명했다. 이상의 연구는 혼인이 해당 지역에서의 정착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화연, 이대응, 2022: 279).
정주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 환경이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통 편의성, 문화·여가 시설, 안전성 등이 포함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년층의 이동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에 경제적 기회와 함께 교육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한 진혜민(2021)은 경상북도 청년을 대상으로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주여건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돌봄 여건과 안전 여건, 생활체육 여건이 높은 집단의 정주 만족도가 2.24배 높게 나타났다. 여준기, 최재원, 홍성우(2019)와 이창관, 박선주(2024)의 연구 역시 각각 구미시와 대구시 청년들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민의 계속 거주 의사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대기 오염, 녹지 공간 등의 환경 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안전의식 수준 등의 물리적 요소가 정주 여건 및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해당 항목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신, 허성욱(2023)도 의료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더불어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선호가 대구시 거주 청년층의 정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에는 지자체 청년정책이 정주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유경한, 이민희(2023) 연구는 정읍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의 이해 정도, 지역공동체 참여율, 정보문화자원의 교류라는 세 가지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바 있다. 그 결과, 문화복지정책이 지역사회의 관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주 혹은 이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화연, 이대응(2022) 연구는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강원도로 전입한 청년층에서 지역 내 청년정책이 정주의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했다. 이때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청년집단에서는 청년정책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청년들에 한해 지역 내 정책 수준이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정주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여가 활동 공간을 확대하거나 청년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요소이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문화 행사, 스포츠 및 여가 시설 지원은 그 지역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나 주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과 지역 내 관계망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은 사회·정신적 지원이 필요할 때 지역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긴다.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고가온 외(2019)는 완주군에 있는 청년 공간이 정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착 과정 중 초기 단계에 있는 집단의 경우, 청년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의 환경적 만족도와 연결되어 정주 지속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현, 박지영(2023)은 지방에 대한 청년세대의 장소정체성 형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주시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 초반에 촬영된 장소를 보면 지역에 대한 호기심, 이주청년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된 장소가 주류였으나, 후반에는 삶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장소,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장소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청년층의 인구 이동과 정착 특성, 유인 요인들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광역권 혹은 단일지역만을 분석대상지로 선정해 지역 간 특성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지방이라도 산업구조나 교육 인프라, 생활 편의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정주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경우, 결과가 왜곡되거나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 또한 현행 연구들은 청년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가정 배경에 따라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의 이동 및 정주 패턴, 혼인율 역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로 청년층의 정착과 혼인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요 3개 도시를 선정하고, 현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청년층의 집단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지역이동 패턴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해 혼인 여부와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하려 한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인구의 유입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10%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뒤 전 국민의 2%(약 90만 명)에 대한 개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단위의 인구 또는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군구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해 주요 도시 내 청년층의 인구 이동 패턴을 살펴보고, 개인 특성, 일자리 특성, 지역이동경로 유형별로 혼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에 의거, 만 19~34세 범주에 속한 응답자를 추출하였고, 이 중 결측이 없는 사례 7,891명을 선정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지역 선정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1~3순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4년 8월 기준, 청주시는 충청북도, 천안시는 충청남도,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각각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규모 순으로 서열화시킬 때, 청주시는 7위, 천안시는 10위, 전주시는 12위를 차지했다. 3개 도시의 청년인구는 청주시가 21.1%, 천안시 22.0%, 전주시 20.3%로 모두 전국 수치(19.4%)를 상회했다. 다만, 순이동 비율은 시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청주시와 천안시는 전출보다는 전입인구의 수가 많아 전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전주시는 이와 달리 전출 인구가 더 많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세 도시 모두 지방 중추 도시이나, 지역별로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행정과 교육 중심지로, 공공기관과 대학이 밀집해 있고, 반도체, 바이오, 화학, 식품 산업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 및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자녀 교육을 고려한 가구들의 정주율이 높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시는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고, 활발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산업·교통 중심 도시이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며, 첨단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대기업 공장이 다수 위치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 이에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24년 기준 총인구는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층 유입 역시 활발하지만, 반대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많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교육 중심지이면서도 문화·예술·관광이 강점인 도시이다. 가족 단위 거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춰 전통적으로 정주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기반 부족으로 일자리 선택지가 적어 최근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도시의 경제적 특성, 교통망, 교육·문화적 환경 등은 청년층의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별 특성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과 유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과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 외 도시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라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지방 중점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3개 시의 주요 특성 비교
| 구분 | 인구 현황 | 인구 이동 |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위 | ||||
|---|---|---|---|---|---|---|---|
| 총인구 | 청년인구 | 총전입 | 총전출 | 순이동 | |||
| 수 | 비중 | ||||||
| 전국 | 51,271,480 | 9,968,817 | 19.4 | 439,892 | 439,892 | 0 | - |
| 청주시 | 853,187 | 180,269 | 21.1 | 9,866 | 9,215 | 651 | 7위(충청북도 최다/ 지방자치시 최다) |
| 천안시 | 658,320 | 144,889 | 22.0 | 6,347 | 6,314 | 33 | 10위(충청남도 최다) |
| 전주시 | 639,354 | 129,929 | 20.3 | 5,555 | 5,976 | -421 | 12위(전북특별자치도 최다) |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2024a, 국가통계포털, 2024. 10. 2. 검색.
3. 변수 구성
가. 주요 변수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내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생지가 일치한 경우, 동일 지역 출생자로 정의해 1로, 타 시도에서 출생한 자는 2로 코딩하였다. 5년 전 거주지 역시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지역 거주자로서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타 시도에서의 전입자로 명명해, 2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생지→5년 전 거주지→현 거주지의 이동 경로에 따라 ①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계속 거주: 미이동), ② 현 거주지→타 시도→현 거주지(귀환 이동), ③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전입: 최소 5년 이상), ④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전입: 최근 5년 이내)의 4개 집단으로 이동 유형을 범주화했다.
나. 종속변수: 혼인 유무
혼인 유무는 ‘당신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 문항을 토대로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초혼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첫 혼인 이후의 사별과 이혼 사례는 기혼으로 분류하였다.
다.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직업 유형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성별(남성=1, 여성=2)과 교육 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1, 대학교 졸업 이상=2)은 더미변수화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때 아르바이트나 다른 가족의 일을 도와준 경우도 포함된다. ‘주로 일하였음’은 1로, ‘가사, 학업(학교, 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은 2로,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은 3으로, ‘일하지 않았음’은 4로 분류하였다. 직업유형은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 비경제활동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2
변수 정의
| 변수명 | 조작적 정의 |
|---|---|
| 성별 | 남성=1, 여성=2 |
| 만연령 | 자연로그 |
|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1, 대학교 졸업 이상=2 |
| 경제활동 상태 | 주로 일하였음=1, 틈틈이 일하였음=2, 일시휴직=3, 일하지 않았음=4 |
| 직업 유형 |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1, 서비스·판매종사자=2, 농·어업, 단순·노무 종사자=3, 비경제활동자=4 |
| 혼인상태 | 미혼=1, 기혼=2 |
| 출생지 동일 여부 | 동일 지역 출생자=1, 타 시도 출생자=2 |
| 5년 전 거주지 동일 여부 | 동일 지역 거주자=1, 타 시도에서의 전입자=2 |
| 지역이동 경로 (출생지→5년 전 거주지→현 거주지) |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계속 거주: 미이동)=1 현 거주지→타 시도→현 거주지(귀환 이동)=2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전입: 최소 5년 이상)=3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전입: 최근 5년 이내)=4 |
Ⅳ.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에 투입된 표본은 총 7,981명으로, 이 중 청주시가 3,201명(40.6%), 천안시 2,611명(33.1%), 전주시 2,079명(26.3%)이었다. 성비 구성을 보면, 남녀 비율이 각 50.6%(3,989명), 49.4%(3,902명)로 유사하였으며, 이 중 청주시는 남성 1,617명(50.5%), 여성 1,584명(49.5%), 천안시는 남성 1,332명(51.0%), 여성 1,279명(49.0%), 전주시는 남성 1,040명(50.0%), 여성 1,039명(50.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55세로, 3개 도시 지역의 평균 연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대부분(79.1%, 6,238명)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0.9%(1,653명)로 적었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청년층 비율은 전주시가 83.6%(1,738명)로 청주시(79.6%, 2,549명)와 천안시(74.7%, 1,951명)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1주일간의 경제활동 상태는 ‘주로 일하였음’이 51.5%(4,064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하지 않았음’ 38.7%(3,052명), ‘틈틈이 일하였음’ 7.7%(607명), ‘일시휴직’ 2.1%(168명) 순이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일하지 않았음’이라 답한 청년층의 비율이 44.8%(932명)로 청주시(36.3%, 1,163명)와 천안시(36.7%, 957명) 대비 약 8%p 높았다. 비경제활동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48.3%(2,335명),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 30.6%(1,480명), 서비스·판매종사자 21.2%(1,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시별로, 청주시와 전주시는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비율이 평균 40%대,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평균 30%대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전주시의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비율은 55.6%(638명), 농·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20.0%(229명)로 직업 유형에 따른 종사율 간극이 비교적 컸다. 한편, 응답자의 다수(6,212명, 78.7%)가 미혼 상태였으며, 기혼자는 1,679명(21.3%)으로 적었다. 이 중 전주시의 미혼 비율이 83.4%(1,734명)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77.6%(2,483명), 천안시가 76.4%(1,995명) 순이었다.
표 3
표본의 특성
| (N=7,891, 단위: 명, %) | |||||
|---|---|---|---|---|---|
| 구분 | 청주시 | 천안시 | 전주시 | 전체 | |
| 성별 | 남성 | 1,617(50.5) | 1,332(51.0) | 1,040(50.0) | 3,989(50.6) |
| 여성 | 1,584(49.5) | 1,279(49.0) | 1,039(50.0) | 3,902(49.4) | |
| 만연령 | 평균(표준펀차) | 26.70세(4.45) | 26.62세(4.48) | 26.22세(4.46) | 26.55세(4.47) |
|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52(20.4) | 660(25.3) | 341(16.4) | 1,653(20.9) |
| 대학교 졸업 이상 | 2,549(79.6) | 1,951(74.7) | 1,738(83.6) | 6,238(79.1) | |
| 경제활동 상태 | 주로 일하였음 | 1,721(53.8) | 1,392(53.3) | 951(45.7) | 4,064(51.5) |
| 틈틈이 일하였음 | 246(7.7) | 198(7.6) | 163(7.8) | 607(7.7) | |
| 일시휴직 | 71(2.2) | 64(2.5) | 33(1.6) | 168(2.1) | |
| 일하지 않았음 | 1,163(36.3) | 957(36.7) | 932(44.8) | 3,052(38.7) | |
| 직업 유형 (n=4,839) | 관리자·전문가·사무 | 1,007(49.4) | 690(41.7) | 638(55.6) | 2,335(48.3) |
| 서비스·판매 | 400(19.6) | 344(20.8) | 280(24.4) | 1,024(21.2) | |
| 농·어업, 단순·노무 | 631(31.0) | 620(37.5) | 229(20.0) | 1,480(30.6) | |
| 혼인상태 | 미혼 | 2,483(77.6) | 1,995(76.4) | 1,734(83.4) | 6,212(78.7) |
| 기혼 | 718(22.4) | 616(23.6) | 345(16.6) | 1,679(21.3) | |
| 전체 | 3,201(100.0) | 2,611(100.0) | 2,079(100.0) | 7,891(100.0) | |
2. 지역이동 경로별 특성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의 동일 여부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출생지와 현 거주지가 동일한 자는 45.9%(3,621명), 타 시도 출생자는 54.1%(4,270명)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χ²=493.523, p=0.000). 3개 시별로 출생지와 현 거주지가 동일한 집단의 비율 차이가 뚜렷했다. 전주시의 경우, 해당 청년층 비율이 58.6%(1,219명)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 역시 51.7%(1,655명)로 계속 거주 집단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동일 지역 출생자는 28.6%(747명)에 불과해 타 시도 출생자 비율(71.4%, 1,864명)의 1/3 수준에 그쳤다. 타 시도 출생자의 본 거주지도 차이가 나타났다(χ²=117.147, p=0.000). 청주시와 천안시는 수도권(각 35.8%, 41.0%)과 중부권(각 37.8%, 27.9%) 출신이 많았으나, 전주시는 호남권 출신이 59.8%(51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청년의 인구 이동 패턴이 각각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청주시와 천안시는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특히 천안시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의 높아 해당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다. 반면 전주시는 호남권에서 중요한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인구 유입의 주된 원천이 전북특별자치도 및 호남권 내 다른 지역으로 제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소 5년 전부터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청년층은 71.7%(5,656명)로 대부분이었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비율은 28.3%(1,186명)였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했다(χ²=175.481, p=0.000). 3개 시 역시 최소 5년 전 현 거주지로 전입한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으나, 청주시와 전주시(각 76.4%)에 비해 천안시(62.1%)의 해당 비율이 다소 낮았다. 청주시와 전주시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현 거주지로 전입한 청년층의 본 거주지를 살펴보면, 청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중부권(각 42.7%, 45.0%)에서의 유입 비율이, 전주시는 호남권(61.4%)에서의 유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
출생지, 5년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 동일 여부
| (N=7,891, 단위: 명, %) | |||||||
|---|---|---|---|---|---|---|---|
| 구분 | 청주시 | 천안시 | 전주시 | 전체 | χ² | ||
| 출생지- 현 거주지 동일 여부 | 동일 지역 출생자 | 1,655(51.7) | 747(28.6) | 1,219(58.6) | 3,621(45.9) | 493.523 (0.000)*** | |
| 타 시도 출생자 | 1,546(48.3) | 1,864(71.4) | 860(41.4) | 4,270(54.1) | |||
| 수도권 | 553(35.8) | 764(41.0) | 208(24.2) | 1,525(35.7) | 117.147 (0.000)*** | ||
| 중부권 | 584(37.8) | 520(27.9) | 82(9.5) | 1,186(27.8) | |||
| 호남권 | 115(7.4) | 232(12.4) | 514(59.8) | 861(20.2) | |||
| 영남권 | 294(19.0) | 348(18.7) | 56(6.5) | 698(16.3) | |||
| 5년 전 거주지- 현 거주지 동일 여부 | 동일 지역 거주자 | 2,445(76.4) | 1,622(62.1) | 1,589(76.4) | 5,656(71.7) | 175.481 (0.000)*** | |
| 타 시도에서의 전입자 | 756(23.6) | 989(37.9) | 490(23.6) | 2,235(28.3) | |||
| 수도권 | 237(31.3) | 315(31.9) | 97(19.8) | 649(29.0) | 668.467 (0.000)*** | ||
| 중부권 | 323(42.7) | 445(45.0) | 57(11.6) | 825(36.9) | |||
| 호남권 | 59(7.8) | 98(9.9) | 301(61.4) | 458(20.5) | |||
| 영남권 | 137(18.1) | 131(13.2) | 35(7.1) | 303(13.6) | |||
| 전체 | 3,201(100.0) | 2,611(100.0) | 2,079(100.0) | 7,891(100.0) | - | ||
출생지→5년 전 거주지→현 거주지의 경로별 청년층 비율을 살펴보면,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한 지역 미이동 집단(①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의 비율이 40.7%(3,208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타 시도에서 태어났으나, 최소 5년 전 현 거주지에 정착한 집단(③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이 25.4%(528명),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서 출생했으나, 최근 현 거주지에 정착한 집단(④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이 16.0%(332명)를 차지했다. 현 거주지에서 태어났으나, 타 시도로 이동 후 최근 현 거주지로 전입한 집단(② 현 거주지→타 시도→현 거주지)의 비율은 5.2%(413명)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전주시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현 거주지가 모두 일치하는 계속 거주 집단의 비율이 51.0%(1,061명)로 타 시에 비해 높았다. 청주시 역시 47.2%(1,510명)로 현 거주지에 계속 머무는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천안시의 지역 미이동 집단은 24.4%(637명)로 두 도시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신 타 시도에서 태어났으나 현 거주지로 전입한 집단(③+④)의 비율이 71.4%(1,864명)로, 청주시(48.3%)와 전주시(41.4%)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청주시와 전주시의 지역이동 경향이 유사한 특징을 보인 가운데, 2개 지역에서는 계속 정주 집단이, 천안시는 타 시도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이동 경로별 표본 수
| (N=7,891, 단위: 명, %) | |||||||||
|---|---|---|---|---|---|---|---|---|---|
| 구분 | 출생지 | → | 5년 전 거주지 | → | 현 거주지 | 청주시 | 천안시 | 전주시 | 전체 |
| ① | 현 거주지 | → | 현 거주지 | → | 현 거주지 | 1,510(47.2) | 637(24.4) | 1,061(51.0) | 3,208(40.7) |
| ② | 현 거주지 | → | 타 시도 | → | 현 거주지 | 145(4.5) | 110(4.2) | 158(7.6) | 413(5.2) |
| ③ | 타 시도 | → | 현 거주지 | → | 현 거주지 | 935(29.2) | 985(37.7) | 528(25.4) | 2,448(31.0) |
| ④ | 타 시도 | → | 타 시도 | → | 현 거주지 | 611(19.1) | 879(33.7) | 332(16.0) | 1,822(23.1) |
| 전체 | 3,201(100.0) | 2,611(100.0) | 2,079(100.0) | 7,891(100.0) | |||||
3. 지역이동 경로에 따른 혼인 특성
청년층의 지역이동 경로별 혼인 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30.369(p=0.000)로 유의미해 집단 간 혼인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기혼 비율은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 집단(④)이 29.5%로 가장 높았고, 현 거주지→타 시도→현 거주지(②) 22.3%,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③) 22.1%,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①) 15.9% 순이었다. 계속 정주한 집단과 신규 유입된 집단의 구도로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서 지내다 현 거주지로 전입한 청년층의 혼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시에서도 집단별 혼인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의 χ²값은 각 41.844(p=0.000), 44.762(p=0.000), 40.736(p=0.000)으로 모두 유의했다. 천안시는 전체 집단의 기혼 비율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5년 내 현 거주지로 전입한 청년층의 혼인 비중이 30.7%로 특히 높았다. 청주시는 현 거주지로 이동해 최소 5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혼인 비율이 25.8%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2개 시 모두 신규 유입된 청년층의 혼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주시에서도 최근 전입한 청년층의 혼인 비율이 26.5%로 높은 편이었으나, 다른 시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해 장기 거주하는 집단의 혼인 비중은 15.5%로 매우 낮았다. 현 거주지에서 이탈하지 않은 미이동 집단의 혼인율도 12.9%에 불과했다.
4. 혼인 확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 만연령, 경제활동 상태, 직업 유형, 지역이동 경로가 유의했다. 분석 모형의 χ²값은 2503.173(p=0.043)이었다. 먼저, 남성 대비 여성의 혼인 승산이 58.1% 높았고, 연령과 혼인 가능성은 비례했다. 다수의 선행연구(Oppenheimer, 1988; Kalmijn, 2011; Cherlin, 2004)는 혼인 여부를 결정짓는 데 있어 일자리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혼인 확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자 대비 일시 휴직 상태인 청년층의 혼인 승산이 86.0% 높았다. 일반적으로 일시휴직 상태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결혼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직 상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다. 결혼하게 되면 생활비나 주거비 등 많은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므로 상대적으로 결혼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업유형별로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대비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의 혼인 승산이 17.6% 높았다. 김성준(2015)의 연구는 주로 높은 직업적 지위와 학력,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 연령을 지연시키는 요인임을 설명한다. 관리자나 사무직종사자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커리어를 먼저 쌓거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결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고학력·전문직 집단의 혼인 연령이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학력・전문직이 늦게 결혼하는 것은 단순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 결혼 자체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오지혜, 임정재, 2016). 김영아 외(2022)는 고소득 남성들의 경우,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지혜 외(2016)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질 때 혼인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임병인, 서혜림(2021)의 연구에 의거, 단순종사자나 농어업종사자는 결혼과 가족 형성을 중요한 삶의 요소로 간주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른 결혼을 통해 가구 경제를 함께 꾸려가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 안정성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이나 공동체 중심의 생활에 더 큰 중점을 둘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직업 유형별 가치관, 경제력 등의 차이가 혼인 승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했다.
지역이동 경로도 유의미했다.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④) 집단의 혼인 승산이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①) 대비 41.6%,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③) 대비 27.6%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 사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본 연구는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별로 혼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상세히 탐색하였다. 먼저, 청주시 분석 모형의 χ²값은 1077.738(p=0.043)로 유의했다.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만연령, 지역이동 경로만이 혼인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혼인 승산이 남성보다 56.9% 높았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 승산도 49.2% 높아졌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지역이동 경로별 혼인 확률을 살펴보면,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④) 집단의 혼인 승산이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①)보다 41.6% 높았다.
천안시 분석 모형의 χ²값 역시 868.926(p=0.000)으로 유의했으며, 성별, 만연령, 직업 유형, 지역이동 경로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남성 대비 여성(57.9%)이, 나이가 많을수록(47.8%) 혼인 확률이 높아졌다. 직업 유형의 경우,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대비 혼인 이행 정도(33.8%)가 높았다. 지역이동 경로별로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④) 집단의 혼인 승산이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①) 대비 29.7%, 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③) 대비 30.4% 높았다.
전주시 분석 모형의 χ²값도 555.547(p=0.000)로 유의했다. 청주시 및 천안시 분석 모형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만연령, 지역이동 경로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교육 정도, 경제활동 상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앞의 2개 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 대비 여성(58.5%)이, 나이가 많을수록(44.9%) 혼인 승산이 높아졌다. 반면, 2개 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교육 특성이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혼인 확률이 1.598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학업 대신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나, 대학 졸업자는 학업 후 취업까지의 시간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Isen et al., 2010). 또한, 특정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Nagdeve et al.(2023)의 연구나 Girls Not Brides(2018)의 기고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사회적 기대나 관습이 결혼 시기와 같은 가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전통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교육보다 결혼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 결혼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경제활동 상태도 혼인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로 간주되었다. 무직인 청년집단보다 경제활동 중이나 일시 휴직 상태인 집단의 혼인 확률이 무려 2.988배나 높았다. 취업 상태나 직업의 특성에 따라 초혼 연령이 달라지는 현상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김성준, 2015; 유진성, 2016). 남녀 모두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초혼 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감을 갖추기 전에 결혼을 미루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동 경로별로는 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④) 집단의 혼인 승산이 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①) 대비 38.3%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지역이동 경로에 따른 혼인 승산을 도시별로 비교하면,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모두 비교적 최근 현 거주지로 유입된 청년집단(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이 계속 거주 집단(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천안시는 신규 유입된 집단 내에서도 최소 5년 전 전입한 집단(타 시도→현 거주지→현 거주지)보다 5년이 채 되지 않은 집단의 혼인 승산이 높았다. 지역적 정착과 결혼의 상관관계는 문화적 맥락, 경제적 동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안정성이 갖는 무게감이 다른 요인보다 크다. 앞서 경제활동 여부와 혼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은 청년이면서 동시에 비경제활동자인 집단의 혼인율이 특히 낮았다1). 신규 유입된 청년층의 경제활동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2)에 의거, 타지에서 유입된 집단이 이주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얻거나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찾은 경우, 결혼에 관한 관심이나 실제적인 혼인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원주민 청년은 주변에서 유입되는 또 다른 집단 간의 취업 경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 결혼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김화연, 이대웅(2022)이나 최선, 이정은(2022) 등의 기존 연구와도 맥이 같다.
경제적 안정성 외에도 새로운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결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주해 온 사람들은 빠르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할 수 있는데, 이때 결혼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이미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삶의 다음 단계로서 결혼을 통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 중심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더 두드러진다(Hammerton, 2017; Bucher et al., 2017). 이러한 경제·사회 및 심리·정서적 맥락들은 신규 유입 집단의 혼인 확률이 기존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표 6
지역별 혼인 확률
| 구분 | 전체(N=7,891) | 청주시(N=3,201) | |||
|
|
|||||
| B(SE) | Exp(B)(p) | B(SE) | Exp(B)(p) | ||
|
|
|||||
| 만연령 | 0.388(0.011) | 1.474(0.000)*** | 0.400(0.017) | 1.492(0.000)*** | |
|
|
|||||
| 성별 | |||||
| (준거: 여성) | 남성 | -0.869(0.071) | 0.419(0.000)*** | -0.841(0.112) | 0.431(0.000)*** |
|
|
|||||
| 교육 정도 | |||||
| (준거: 대졸 이상) | 고졸 이하 | 0.161(0.085) | 1.175(0.056) | 0.137(0.135) | 1.146(0.311) |
|
|
|||||
| 경제활동 상태 | |||||
| (준거: 일하지 않았음) | 주로 일하였음 | -0.008(0.103) | 0.992(0.935) | -0.259(0.162) | 0.772(0.111) |
| 틈틈이 일하였음 | -0.621(0.208) | 0.757(0.136) | -0.431(0.289) | 0.650(0.137) | |
| 일시휴직 | 0.621(0.208) | 1.860(0.003)** | 0.507(0.327) | 1.660(0.121) | |
|
|
|||||
| 직업 유형 | |||||
| (준거: 농어업, 단순노무) | 관리·전문·사무 | -0.193(0.094) | 0.824(0.039)* | 0.012(0.146) | 1.012(0.935) |
| 서비스·판매 | -0.204(0.117) | 0.815(0.080) | 0.019(0.186) | 1.019(0.918) | |
|
|
|||||
| 지역이동 경로 | |||||
| (준거: ④ 타→타→현) | ① 현→현→현 | -0.539(0.084) | 0.584(0.000)*** | -0.586(0.135) | 0.557(0.000)*** |
| ② 현→타→현 | -207(0.153) | 0.813(0.175) | -0.447(0.266) | 0.639(0.092) | |
| ③ 타→현→현 | -0.323(0.086) | 0.724(0.000)*** | -0.275(0.143) | 0.760(0.055) | |
| 상수항 | 4795.986 | 2351.756 | |||
|
|
|||||
| -2로그우도/Nagelkerke R² | 2292.813/0.422 | 1274.018/0.436 | |||
|
|
|||||
| χ2(p) | 2503.173(0.000)*** | 1077.738(0.000)*** | |||
|
|
|||||
| 구분 | 천안시(N=2,611) | 전주시(N=2,079) | |||
|
|
|||||
| B(SE) | Exp(B)(p) | B(SE) | Exp(B)(p) | ||
|
|
|||||
| 만연령 | 0.391(0.018) | 1.478(0.000)*** | 0.371(0.022) | 1.449(0.000)*** | |
|
|
|||||
| 성별 | |||||
| (준거: 여성) | 남성 | -0.866(0.121) | 0.421(0.000)*** | -0.879(0.150) | 0.415(0.000)*** |
|
|
|||||
| 교육 정도 | |||||
| (준거: 대졸 이상) | 고졸 이하 | -0.014(0.133) | 0.986(0.914) | 0.469(0.196) | 1.598(0.017)* |
|
|
|||||
| 경제활동 상태 | |||||
| (준거: 일하지 않았음) | 주로 일하였음 | 0.004(0.165) | 1.004(0.983) | 0.191(0.244) | 1.210(0.435) |
| 틈틈이 일하였음 | -0.127(0.305) | 0.880(0.676) | -0.541(0.432) | 0.582(0.211) | |
| 일시휴직 | 0.338(0.331) | 1.402(0.306) | 1.095(0.489) | 2.988(0.025)* | |
|
|
|||||
| 직업 유형 | |||||
| (준거: 농어업, 단순노무) | 관리·전문·사무 | -0.412(0.150) | 0.662(0.006)** | -0.084(0.233) | 0.919(0.719) |
| 서비스·판매 | -0.315(0.191) | 0.730(0.098) | -0.209(0.268) | 0.811(0.435) | |
|
|
|||||
| 지역이동 경로 | |||||
| (준거: ④ 타→타→현) | ① 현→현→현 | -0.353(0.157) | 0.703(0.025)* | -0.482(0.181) | 0.617(0.008)** |
| ② 현→타→현 | -0.165(0.288) | 0.848(0.566) | 0.125(0.266) | 1.133(0.638) | |
| ③ 타→현→현 | -0.363(0.130) | 0.696(0.005)** | -0.349(0.203) | 0.706(0.086) | |
|
|
|||||
| 상수항 | 1993.551 | 1361.571 | |||
|
|
|||||
| -2로그우도/Nagelkerke R² | 1124.625/0.426 | 806.024/0.395 | |||
|
|
|||||
| χ2(p) | 868.926(0.000)*** | 555.547(0.000)*** | |||
Ⅴ. 결론
지방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사회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도별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도시의 지역이동 현황을 비교하고, 장래 추계를 예측하는 것은 지방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 연구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청년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내부에서의 청년 정착과 혼인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지방 중점 도시 중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3개 지역의 인구 이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혼인행태를 분석해 지역 정착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에 입각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도시별 청년인구의 유입 특성과 고용상태 등을 탐색한 결과, 청주시와 천안시는 전입인구가, 전주시는 전출 인구가 더 많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청년들이 특정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이다. 지역 거주 청년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청주시와 천안시는 제조업 종사 비율이, 전주시는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통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생산 공정,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기술 집약적이고 고도화된 제조업(첨단 전자,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이 발달한 지역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타 지역의 청년들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다. 청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청년층 유입에 유리한 편이나, 전주시는 문화와 전통 산업에 강점을 가진 지역으로, 제조업 기반만으로는 두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청년층의 인구 이동을 이끄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청주시와 전주시의 지역이동 경향이 유사한 가운데 2개 지역에서는 계속 정주 집단이, 천안시는 타 시도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주시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현 거주지가 모두 동일한 계속 거주 집단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천안시의 경우, 지리적 이점, 산업 발전, 교육과 일자리 기회, 청년 친화적 정책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은 청년층이 새롭게 유입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반면, 청주시와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두 도시의 지역적 특성, 산업구조, 사회적 정착 요인들이 장기 거주에 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으로 혼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남성 대비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혼인 확률은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자 대비 일시 휴직 상태일 때,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대비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 혼인 승산이 더 높았다. 지역이동 경로도 유의미했다. 이를 도시별로 구분하면,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모두 비교적 최근 현 거주지로 유입된 청년집단(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이 계속 거주 집단(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은 경제적 안정성, 취업 여부, 주거 안정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지를 갖춘 경제활동자들은 결혼에 적극적이나, 비경제활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의 부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혼인율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신규 유입된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거주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본 분석 결과는 혼인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경제력에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전주시는 대규모 제조업이나 첨단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천안시나 수도권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여건이 열악할 수 있다.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주시 권역 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한 청년들은 혼인을 결정하는 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혼인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청주시와 전주시는 계속 거주 집단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청년층의 혼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 내 기존 청년보다 혼인에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시 역시 타 시도 출생자의 비율이 높고,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신규 유입된 5년 미만 거주 집단의 혼인 승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집단의 경우, 경제활동 비중이 타 집단보다 많았다. 이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아 유입된 청년층이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기반으로 결혼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집단이 혼인에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혼인 의향이 높거나, 혼인을 계기로 특정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을 수 있다. 이는 혼인이 단순한 개인의 사적 선택을 넘어, 지역 정착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혼인과 정주의 상관성이 확인된 바 있으며, 혼인은 안정된 삶의 구축을 위한 핵심 단계로서 특정 지역에 장기 정착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혼인 친화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같은 지방 도시라 하더라도,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문화적 특성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청년층의 인구 이동 양상과 결혼을 매개로 한 지역 정착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장기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유입 요인이 다른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층이 경제적·사회적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청주시는 기존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지원 강화, 천안시는 청년층 유입 촉진과 장기 정착 지원, 전주시는 청년층 유출 방지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 요구될 수 있다.
먼저 각 지역의 산업·고용 구조와 청년층의 정착 패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주시는 행정·교육 중심지이자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존재하며, 지역 내 대학들도 많아 청년층의 장기 거주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취업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지원금,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등을 적극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천안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문화·전통 산업이 강점인 도시지만, 대규모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이 부족하여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졌다. 특히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는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IT·디지털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확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미디어 산업 등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북대·전주대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IT 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혼인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최근 이주한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혼인 이행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정주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을 매개로 한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정주 유인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 지역 내 결혼·양육 친화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 반면, 계속 거주 중인 청년층은 비경제활동 비중이 컸고, 혼인율은 낮았다. 해당 집단의 경우,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질 개선과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취업 박람회,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이 지역 기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도 기존 거주 청년층의 결혼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장기적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유입과 결혼 확률 간의 관계, 특히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간의 결혼 확률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3개 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예측 가능케 하는 기초자료로써의 활용 가치가 있으나,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데이터의 제약으로 결혼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청년층의 결혼 결정에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관계, 가족 배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구역 단위로 자료가 제공되어 특정 지역의 인구 이동 및 혼인 패턴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였으나, 혼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결혼 연도나 혼인 전후 거주지 이동 여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혼인과 정착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제약이 존재한다. 혼인과 거주지 이동의 관계는 다방향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유념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혼인 시점을 포함해 다양한 변인이 구성된 패널 데이터나 행정 자료들을 활용,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적 요소나 지역 내 문화적 가치관, 양육 지원 제도와 같은 정책적 요인을 포함해 결혼 결정의 복잡성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과 일자리 등 이동의 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도입하여 연령에 따른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학 여부나 졸업 시점을 변수로 추가하여, 특정 집단의 이동 동기와 혼인 결정 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거나, 졸업 시점이나 재학 여부를 통제하는 등 동일한 청년층 집단이라 하더라도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연령대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후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반영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인구 이동과 청년층의 결혼 결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다룬 정책 방향은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년층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세부 정책 설계는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재정 상황,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Notes
References
. (202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3&act=view&list_no=428215
. (2024a).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51E&conn_path=I2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0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4-28

- 213Download
- 293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