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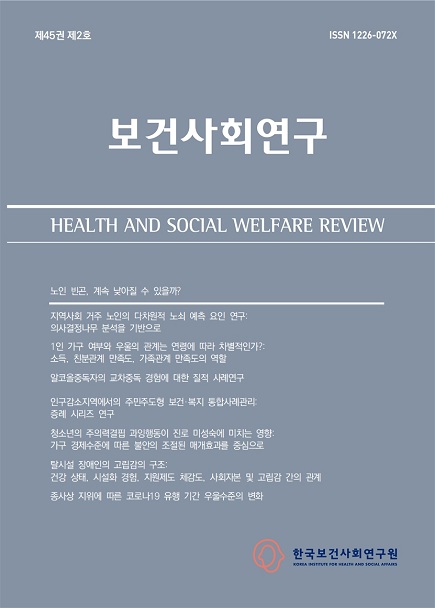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의 사회보장 수급 경험과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cross Support System Types: Comparing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Byun, Geumsu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624-649,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624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사회보장급여, 사회적 관계망으로 측정한 지지체계를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완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개인의 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기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 하나, 근로연령층인 청년,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선별적이고, 포괄성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노년층에게는 준보편적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유형 비교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공적 지지로, 사회관계망을 사적 지지로 정의하고 지지체계 유형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초기중년, 후기중년층은 사적 지지가 높고 공적 지지는 낮았고, 노년은 사적 지지가 낮고 공적 지지는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노년층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경우, 모두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으나, 청년과 중장년은 그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생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사회관계망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loys data from the Surve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Issues in Korea to classify support systems—encompassing both public and private sources—into four distinct types. It then examines how these support system typologies are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in lower-income groups experien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ivation in health and education compared to their higher-income counterpart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support system types varies systematically by income level. Lower-incom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society as insecure, and 12.7% of them fall into Type 1—characterized by a lack of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 compared to 7.9% in the higher-income group. Type 4, which denotes access to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 is most prevalent among the elderly (62.0%) and least among the late middle-aged (16.4%). The youth exhibit the second-highest proportion in this category after the elderly. Among younger individuals, those with lower income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heightened social insecurity, and this perception is further shaped by the type of support system to which they belong. In contrast, the elderly demonstrate a somewhat different pattern: public support systems appear to partially mitigat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in this group. This suggest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play a buffering role in alleviating the sense of insecurity associated with age-related social risks.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수급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의 사회문제 경험과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4세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19-34세 청년층은 32.2%로 노년층 다음으로 이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은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었다. 노년층은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Ⅰ. 서론
이 연구는 공적 지지체계(사회보장 수급)와 사적 지지체계(사회관계망)로 지지체계를 유형화하고, 지지체계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1)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5.1%에서 2020년 15.6%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20),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1%에서 2023년 14.9%로 지속해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4). 하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인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국가통계연구원, 2025),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40여 명의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통계청, 2025). 2004년 세 모녀가 극심한 빈곤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죽음은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변금선, 최지원, 2025). 고독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으로 확산되고, 이제는 청년에게서도 빈번하게 관측되며, 사회와 단절된 채 고독‘생’을 살아가는 고립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한국 사회를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현주 외, 2023).
사회적 불안(Social insecurity inception)은 사회의 불안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과 이로 인한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을 반영한다(변금선, 이혜림, 2023). 이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완화하는 기제로서 지지체계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지체계(support system)는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개인적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총체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혹은 공식, 비공식 복지,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포괄한다(배점모, 2008, 2015; Paulsen & Berg, 2016; Pinkerton & Dolan, 2007). 개인이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일차적 자원은 사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구 등 사회관계망이며, 공적 지지체계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기초연금의 시행과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기준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적 지지체계의 발전은 경제적 빈곤에 대한 소득보장을 넘어 돌봄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간병, 양육 등 신체 돌봄의 욕구 증가와 돌봄 부담에서 시작된 신사회 위험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사회적 관계의 결핍’, 즉, 사회적 고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윤민, 김은정, 2023; 김성아, 노현주, 2024; 노혜진, 2018; 변금선, 김정숙, 2024; 유민상, 신동훈, 2021; 윤민석 외, 2024; Taylor-Gooby, 2004).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공·사적 안전망의 특성과 역할을 파악하게 하여,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최근 변화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특성-빈곤, 소득 중심 복지 욕구에서 외로움, 정신건강으로의 복지 욕구 확장과 민간, 공공 지원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을 고려할 때,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공적 지지체계를 반영하는 복지수급 경험과 사적 지지체계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구분하여, 특정 복지제도의 수급 혹은 사회관계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강은나 외, 2015; 남재현, 이래혁, 2020; 노혜진, 2018; 박영란, 박경순, 2013; 변금선, 김정아, 2024; 서정아, 2018; 엄태완, 2008; 이명숙, 2015; 이원진, 2010; 정순둘, 성민현, 2012; 한경혜 외, 2003), 소득보장 관점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금현섭, 백승주 2014; 김진현, 2021; 원경혜, 이상혁, 2015).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적, 공적 지지체계를 포괄하기 어렵고, 사적, 공적 지원을 포괄하려는 연구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비경제적 차원의 지지체계의 실태와 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포괄하고,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의 총합으로서 개인의 지지체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러한 지지체계가 개인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지지체계 특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주목한다. 공적 지지체계인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소득보장제도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일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실업, 노년층의 은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대응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안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연령층이지만 노동시장 밖 혹은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은 고용보험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이승윤 외, 2016; 변금선 외, 2023). 이에 더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과 양육 기반의 소득지원은 미혼 청년층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 돌봄서비스도 소득보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적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자녀 돌봄과 장애인, 노인 돌봄에 집중되어 있다. 사적 지지체계는 가족, 친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의미하는데(민기채, 이정화, 2008; 장수지, 2010), 청년기에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망이 중장년, 노년이 되면서 점차 약화한다고 보고된다(김성아, 노현주, 2024). 하지만 1인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 연장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2)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 초기중년과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를 포괄하는 지지체계 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연령 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는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생애주기 중심의 분절적 사회보장제도-공적 지지체계가 개인이 살아가는 연속적인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망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사적 지지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불안과 지지체계의 개념
사회적 불안에 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주로 사회경제적 불안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이현주 외, 2023: pp. 23-24). 불안은 정치경제학, 정신의학, 사회학과 사회정책 관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사회에 관한 안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개인의 정신병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 안전망(security net)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사회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서의 불안(social insecurity)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 연구에서 불안은 세 번째 사회학과 사회정책 관점의 사회적 불안이다. 이때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위험을 소거하거나 완화는 기제의 결핍 혹은 불충분에서 비롯되는 불안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 사회적 불안은 객관적, 주관적으로 정의,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불안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불안 수준이다. 불안 인식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불확실한 위험 혹은 주관적 기대와 정서를 반영한다(Mau et al., 2012, pp. 656-657; 송관재 외, 2004, 이현주 외, 2023 재인용).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재로서 지지체계에 주목한다. 지지체계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으로서 공적, 사적 안전망의 총체이다. 지지체계는 경제적, 비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의미하며, 그 특성과 구조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지지체계는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미시적 관계,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사회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 관점에서 미시와 중시, 거시적 차원을 포괄하는 사회관계망, 시민사회 등을 포괄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클라이언트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개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된다(김미령, 2005, p. 100). 광의의 사회적 지지는 쌍방향적 관계로서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구조의 내용이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Lieberman, 1985; 김미령, 2005, p. 103 재인용; 주유선, 2020).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세분화되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심리 정서적 지지의 수준과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염희정, 한창근, 2022; 오승환, 2007; 이명숙, 2015; 임안나, 박영숙, 2017; Paulsen & Berg, 2016; García-Faroldi, 2015; Zimet et al., 1988).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로 결혼, 우정, 가족의 결속과 실존적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인식하는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포괄한다(김미령, 2005, pp. 102-103). 한편, 사회적 지지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공식적 지지와 가족, 친척, 동료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Pinkerton & Dolan, 2007), 위기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비공식 지지가 부족할 때 공식적 지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Hedin, 2017; Stein, 2008).
한편, 사회자본 이론은 인간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 네트워크가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범위 역시 다양한데,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제공을, 콜맨(Coleman)은 다양한 형태의 실체로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퍼트남(Putnam)은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상호호혜 규범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경제적 안정성, 건강,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5; Scrivens & Smith, 2013 pp. 12-15 재인용). 특히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인식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교적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개인, 집단에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것이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Bourdieu & Wacquant, 1992, p. 119; Scrivens & Smith, 2013 p. 12 재인용). OECD는 이러한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체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 기회의 제한, 타인과의 접촉 부족, 그리고 결국 고립감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가족 해체, 실직, 질병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이후에 발생한다고 지적한다(OECD, 2025).
이 연구는 지지체계를 공적, 사적 지지체계로 구분한다. 사적 지지체계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로,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관계의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개인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위험 대처 기제를 결정하는 인간 삶의 생활양식에 근본적 변화가 관측되고 있으며(김수영 외, 2022),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의 관점에서 사회관계망이라는 비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한편, 공적 지지체계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 중 하나로 공공기관, 국가의 복지제도를 포함하며, 공적 지지체계를 기반으로 구조적 사회적 지지인 실존적 사회관계망과 사회자본(사회에 관한 연대감, 신뢰, 소속감 등)이 형성될 수 있다.
2. 사회적 위험,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고려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 변화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표준적이고, 보편적 형태가 아니라 탈표준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변금선 외, 2024). 생애과정 변화에 의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증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의 이행기 연장과 이 시기 직면하는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변금선, 이혜림, 2022, 2023; 이승호, 이원진, 2022). 복지국가의 이중화(dualization)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반영하는 공적 지지체계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 계층화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자격이 안정적 노동을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윤 외, 2016).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 빈곤, 실직,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계층화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비경제적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박탈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충분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적 지지체계를 갖추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공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빈곤층은 가족, 친구 등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빈곤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점차 침식될 수 있다(Lubbers et al., 2020). 50여 년간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검토한 루버스와 동료들은 빈곤층 사이의 네트워크가 만연한 연대, 만연한 고립, 선택적 연대 등 다양한 역동을 통해 작동하며, 네트워크가 빈곤층의 상향이동과 생존을 방해하고, 고립, 취약성, 관계적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ubbers et al., 2020). 이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유무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저소득층 혹은 사회배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변금선, 이혜림, 2022, 2023; 서울시·서울연구원, 2022; 이혜림, 변금선, 2023; 정세정 외, 2021).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큰 집단에 공적 지지체계는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빈곤층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상호호혜적 특성과 장기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의 낙인감이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을 해체하고 고립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복지시스템과 복지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Böhnke, 2008; Lubbers et al., 2020). 하지만 공적 지지체계인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낮은 접근성, 엄격한 자격기준 등으로 인한 제도적 제약은 사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집단이 공적 지지체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윤민석 외, 2024).
이러한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가?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이나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역량, 심리적 안녕(주관적 웰빙)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왔는데, 사회적 자본(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심리 정서적 지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거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우울을 낮추고,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강은나 외, 2015; 김윤민, 김은정, 2023; 김미령, 2005; 노혜진, 2018; 박영란, 박경순, 2013; 박희수, 문승연, 2014; 배점모, 2015; 서정아, 2018; 엄태완, 2008; 염희정, 한창근, 2022; 오승환, 2007; 이명숙, 2015; 임안나, 박영숙, 2017; 변금선, 김정숙, 2024; 정순둘, 성민현, 2012; 최성수 외, 2024; 한경혜 외, 2003). 공적 지지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빈곤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거나(금현섭, 백승주 2014; 원경혜, 이상혁, 2015), 소득 불평등 인식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김진현, 2021; 남재현, 이래혁, 2020; 이원진, 2010). 사회보장제도 수급을 의미하는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제도, 복지국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즉, 탈상품화가 높은 국가의 행복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다(유정민, 최영준, 2020; Anderson & Hecht, 2015).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의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Sjöberg, 2010), 이러한 경향은 청년에 한정해 분석하였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우리와 운트는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실업급여의 관대함과 적용 범위)이 실업 청년의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Lauri, & Unt, 2021).
한편,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연령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사적 지지체계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제도가 생애과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교집합으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의 변화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김성아와 노현주(2024)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년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장년층은 오히려 고립수준이 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김성아, 노현주, 2024). 2023년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인 인구 비율은 7.9%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13-18세 5.2%, 19-34세 5.5%, 35-49세 7.9%, 50-64세 8.4%, 65세 이상 10.7%로 확인되었다(김성아, 노현주, 2024). 한편,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 사각지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전 연령대에 동등한 수준의 관대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선별적 특성이 있는 고용보험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 등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공적 지지체계의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 위험(새로운 복지 욕구)과 공공과 민간 지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유형화한 윤민석 외(2024)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성인 돌봄을 해야 하는 청년 등 기존의 전형적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1차적 지원체계가 없는 경우, 민간, 공공 그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김태완과 한수진(2023)은 빈곤 관점에서 핵심적 복지 사각지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과 중장년을 포괄하는 근로빈곤층,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청년, 1인가구, 고립·은둔, 금융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사적 지지체계는 대체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나, 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약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공적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나 생애주기적으로 연령대별로 적용되는 공적 지지체계의 특성-대상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 복지 욕구의 유형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연구들은 복지제도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를 포괄하는 지지체계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차이가 연령집단 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어떤 지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적 위험(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령 집단별로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다. 먼저, 연령집단,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완화 기제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고, 연령 집단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한 ‘한국의 사회문제 경험과 인식조사’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에는 만 19~44세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만 65~74세, 2022년에는 만 45~64세를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3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령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하면서 표본설계에서 활용된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집단별 구성의 3년 평균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령별 조사 결과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이현주 외, 2023). 한편, 조사 시점의 영향은 사회적 사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한 시기를 포괄한다. 연령집단에는 시기 효과가 포함되며, 시기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개인의 연령을 한 번 더 통제하여 통합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전국 만 19~74세 7,692명이다.3)
2. 분석 방법
1) 지지체계의 유형화
이 연구는 사적지지 유무, 공적 지지 유무 2가지 이분변수를 이용한 K-모드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4가지 지지체계를 유형화하였다. 확률적 군집화 방법인 잠재계층분석은 잠재적인 집단 유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나,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므로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K-모드 군집분석은 각 샘플을 한 군집에 할당하므로 정확도가 높다. 이 연구는 공적지지와 사적지지가 모두 없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다른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확률적 군집화가 아닌 비확률적 군집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음 <표 1>은 지지체계를 유형화한 것이다. 사적 지지체계와 공적 지지체계 유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과 우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적 복지제도 수급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고려할 때, 사적 지지체계와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부재한 유형4의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은 다른 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적 지지체계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를 고려한 지지체계를 유형화한 것이다.
표 1
사적, 공적지지 유무에 따른 지지체계의 유형
| 공적 지지체계 | |||
|---|---|---|---|
| 사회보장 지원 안 받음 | 사회보장 지원 받음 | ||
| 사적 지지 체계 | 도움 줄 사람 없음 | 〔유형1〕 공적, 사적 지지체계 모두 없음 |
〔유형2〕 공적 지지체계 있음 |
| 도움 줄 사람 있음 | 〔유형3〕 사적 지지체계 있음 |
〔유형4〕 공적, 사적 지지체계 모두 있음 |
|
2) 변수 측정
사회적 불안 인식과 지지체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5점 척도(1. 전혀 불안하지 않다~5. 매우 불안하다)로 측정하고. 여기서 4점과 5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해 분석하였다(이하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
지지체계는 사적 지지체계와 공적 지지체계를 포함해 측정하였다. 공적 지지체계는 사회보장제도 수급 경험으로, 사적 지지체계는 기능적 관점에서 사회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 공적 지지체계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공적 복지수급 경험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적 지지체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사적 지지체계는 2020년도 조사는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있는 경우’, 2021년과 2022년 조사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금전 지원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은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공적 지지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학비 지원, 주거지원, 취업 지원, 보육료 지원, 청년 관련 수당,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기타 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아동, 노인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는 적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공적 지지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며, 연령과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구의 복지 욕구에 따라 공적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정책이 다르다. 19~34세 청년과 35~44세 초기중년은 공적 지지체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학비 지원, 주거지원, 취업 지원, 보육료 등 영유아 양육지원, 청년 관련 수당, 일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기타 상담이 포함되며, 45~64세 초기와 후기중년은 청년 관련 수당과 일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상담이 제외되고, 의료지원이 포함된다. 65세 노년층은 기초연금, 공적 연금, 재정지원일자리, 장기요양 등 돌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포함된다.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적 지지체계의 경우, 선별적 급여는 주로 소득 하위층에 집중되어 있고, 보편적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준보편적 급여의 대상인 노년층은 전 계층에서 사회보장 급여 수급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과 중장년층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사적 지지체계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소득계층은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5점 척도(1. 최상, 2. 상. 3. 중, 4. 하. 5. 최하)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적 위험 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의 대리 지표로 박탈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집단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높아진 불안 인식이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통해 낮아지는지 확인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박탈과 돌봄으로 인한 비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박탈 경험은 건강, 돌봄, 주거, 교육 4가지 영역의 박탈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박탈 경험은 응답 대상 연령에 따라 포괄하는 시기가 다소 다르지만, 현재 시점의 박탈 수준을 포괄해 조사하였으므로 공통지표로 간주해 분석하였다. 건강 박탈은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돌봄 박탈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돌봄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본 적이 있다’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거 박탈은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주거비 때문에 낸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있다’ 2개 문항, 교육 박탈은 ‘돈이 없어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학비 때문에 빚을 내 본 적이 있다’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2>는 이 연구의 연구 문제와 분석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을 청년(19-34세), 초기중년(35-49세), 후기중년(50-64세), 노년(65-74세)으로 구분하고, 분석대상의 일반 특성과 소득계층별 지지체계 유형,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 소득계층에 따른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감소 혹은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지지체계의 이중적 격차를 확인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양극화 양상, 지지체계에 따른 불안 강화 혹은 약화 기제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를 고려하여, 세 가지 가설을 상정하였다. 첫째,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박탈 경험 확률이 높으며,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는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과 모두 충족된 유형4에서 가장 클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경향은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에게서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일반 특성
다음 <표 3>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적 불안 점수는 65-74세 노년층이 가장 낮았고, 청년과 초기, 후기중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청년(84.7%), 초기중년(84.5%), 후기중년(78.4%), 노년(59.3%)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체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거나, 낙담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응답자가 사적 지지체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적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80.5%)과 초기중년(80.6%)보다 후기중년(84.2%)과 노년층(86.4%)에게서 다소 높았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였는데, 이는 사적 지지체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후기중년층이 20.2%로 가장 낮았고, 노년층은 70.0%로 가장 높았다. 청년과 초기 중년층은 각각 40.1%, 37.2%였다. 이러한 공적 지지체계의 연령대별 차이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보편적, 선별적 특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박탈 경험률은 교육 박탈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 박탈(26.2%), 주거 박탈(24.3%), 건강 박탈(23.1%)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교육 박탈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다른 세 가지 영역의 박탈률은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본인 소득계층 인식을 확인한 결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년, 후기중년, 청년, 초기중년 순으로 높았다. 청년의 소득계층 인식이 초기중년보다 높은 것은 청년의 이행과 독립 지연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 (단위: 명, %) | |||||||||
|---|---|---|---|---|---|---|---|---|---|
| 구분 | 전체 | 청년 (19-34) | 초기중년 (35-49) | 후기중년 (50-64) | 노년 (65-74) | ||||
| 사례 수(명, %) | 7,692(100.0) | 26.8 | 29.3 | 31.5 | 12.4 | ||||
| 사회적 불안 | 평균(점) | 4.0 | 4.1 | 4.1 | 4.0 | 3.5 | |||
| 불안함 비율 | 79.5 | 84.7 | 84.3 | 78.4 | 59.3 | ||||
| 지지체계 있음 | 사적 지지체계 | 82.5 | 80.8 | 80.6 | 84.2 | 86.4 | |||
| 공적 지지체계 | 36.7 | 40.1 | 37.2 | 20.2 | 70.0 | ||||
| 박탈 경험 있음 | 돌봄 박탈 | 26.2 | 17.0 | 37.8 | 29.4 | 10.6 | |||
| 주거 박탈 | 23.1 | 27.8 | 25.9 | 22.8 | 16.7 | ||||
| 건강 박탈 | 24.3 | 22.2 | 27.2 | 21.8 | 18.5 | ||||
| 교육 박탈 | 36.2 | 40.1 | 37.4 | 31.6 | - | ||||
| 본인 소득 계층 | 상 | 9.3 | 8.1 | 6.7 | 11.2 | 13.3 | |||
| 중 | 38.3 | 40.5 | 39.4 | 37.2 | 33.7 | ||||
| 하 | 52.4 | 51.5 | 54.0 | 51.6 | 53.0 | ||||
| 여성 | 49.2 | 47.2 | 48.8 | 50.1 | 52.4 | ||||
| 평균연령(세) | 46.0 | 26.8 | 42.3 | 56.7 | 68.8 | ||||
| 수도권 거주 | 20.2 | 22.6 | 19.8 | 18.9 | 19.1 | ||||
| 배우자 있음 | 60.1 | 16.5 | 71.9 | 76.4 | 85.0 | ||||
| 가구주 | 51.0 | 29.5 | 55.3 | 63.1 | 56.5 | ||||
| 1인가구 비율 | 14.1 | 15.6 | 11.2 | 16.1 | 12.4 | ||||
| 건강상태 좋음 | 35.8 | 39.0 | 34.2 | 31.0 | 44.9 | ||||
| 자가 거주 | 65.2 | 52.8 | 62.7 | 70.6 | 84.1 | ||||
| 가구 균등화 소득(평균, 만원) | 297.0 | 273.3 | 283.7 | 328.8 | 298.7 | ||||
| 본인 교육 | 중학교 졸업 이하 | 5.9 | 0.7 | 0.6 | 2.3 | 38.6 | |||
| 고등학교 졸업 | 30.5 | 38.7 | 17.6 | 27.7 | 50.5 | ||||
| 대학교 졸업 이상 | 63.6 | 60.6 | 81.8 | 70.0 | 10.9 | ||||
| 현재 경제 활동 상태 | 상용직 | 42.9 | 40.5 | 59.3 | 42.9 | 8.9 | |||
| 임시, 일용직 | 14.1 | 20.3 | 10.6 | 13.2 | 11.0 | ||||
| 고용주, 자영업 | 15.9 | 5.3 | 12.6 | 18.3 | 40.5 | ||||
| 실업자 | 5.3 | 8.3 | 3.8 | 6.4 | - | ||||
| 비경제활동 | 21.8 | 25.6 | 13.7 | 19.2 | 39.6 | ||||
연령집단별 지지체계 유형을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유형4 비율은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청년층은 32.2%로 노년층 다음으로 유형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의 확대와 청년기 높은 사회관계망, 그리고 노인 빈곤과 돌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청년과 초기, 후기중년층은 노년층보다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년층은 사적 지지체계 없이 공적 지지체계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관계망으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김성아, 노현주, 2024), 노년기 사회적 고립 위험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유형1은 남성이, 모두 있는 유형4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형2와 유형3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가 있는 경우인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적 지지인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 자격이 대부분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득 하층이 공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
| (단위: 명, %) | |||||||||
|---|---|---|---|---|---|---|---|---|---|
| 구분 | 유형1 (모두 없음) | 유형2 (공적지지) | 유형3 (사적지지) | 유형4 (모두 있음) | |||||
| 전체(100.0) | 10.9 | 6.5 | 52.4 | 30.1 | |||||
| 성 | 남성 | 12.3 | 6.4 | 52.7 | 28.6 | ||||
| 여성 | 9.5 | 6.7 | 52.1 | 31.7 | |||||
| 연령집단 | 청년 | 11.3 | 7.9 | 48.6 | 32.2 | ||||
| 초기중년 | 11.7 | 7.7 | 51.1 | 29.5 | |||||
| 후기중년 | 12.1 | 3.7 | 67.8 | 16.4 | |||||
| 노년 | 5.6 | 8.0 | 24.4 | 62.0 | |||||
| 가구 구분 | 다인 가구 | 10.4 | 6.3 | 52.2 | 31.1 | ||||
| 1인가구 | 14.4 | 7.8 | 53.8 | 24.0 | |||||
| 건강상태 | 나쁨 | 12.9 | 7.9 | 49.3 | 29.9 | ||||
| 좋음 | 7.5 | 4.0 | 57.9 | 30.6 | |||||
| 교육수준 | 중학교 졸업 이하 | 5.7 | 16.3 | 16.8 | 61.2 | ||||
| 고등학교 졸업 | 11.4 | 7.0 | 46.3 | 35.4 | |||||
| 대학교 졸업 이상 | 11.2 | 5.4 | 58.6 | 24.8 | |||||
|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 12.3 | 4.3 | 60.2 | 23.3 | ||||
| 임시, 일용직 | 10.4 | 7.0 | 46.6 | 35.9 | |||||
| 고용주, 자영업 | 10.0 | 5.2 | 53.6 | 31.2 | |||||
| 실업자 | 10.4 | 14.8 | 39.9 | 34.8 | |||||
| 비경제활동 | 9.5 | 9.6 | 42.9 | 38.0 | |||||
| 소득계층 | 상 | 7.9 | 2.6 | 68.4 | 21.1 | ||||
| 중 | 9.3 | 3.6 | 58.9 | 28.2 | |||||
| 하 | 12.7 | 9.4 | 44.8 | 33.1 | |||||
2. 개인특성별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
<표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노년보다는 청년과 초기중년, 소득 하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일 때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적 지지체계만 있는 유형2의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연령별로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65-74세 이상 노년층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가 지지체계가 없는 유형1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은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층이면서 유형1인 경우,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6.7%였는데, 소득 상층(68.1%)보다 18.6%P 높았다. 이는 소득 하층이면서,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 상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1.3%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소득 하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와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의 불안 인식수준이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지체계의 유형이 사회적 불안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 (단위: %) | |||||||||
|---|---|---|---|---|---|---|---|---|---|
| 구분 | 전체 | 지지체계 유형 | |||||||
| 유형1 (모두 없음) | 유형2 (공적지지) | 유형3 (사적지지) | 유형4 (모두 있음) | ||||||
| 전체(100.0) | 79.5 | 79.6 | 82.1 | 79.6 | 78.6 | ||||
| 성 | 남성 | 75.1 | 75.4 | 77.7 | 75.1 | 74.2 | |||
| 여성 | 84.0 | 85.2 | 86.4 | 84.3 | 82.6 | ||||
| 연령집단 | 청년 | 84.7 | 85.0 | 87.9 | 83.9 | 85.1 | |||
| 초기중년 | 84.3 | 84.3 | 89.0 | 82.9 | 85.3 | ||||
| 후기중년 | 78.4 | 76.3 | 77.3 | 79.3 | 76.7 | ||||
| 노년 | 59.3 | 50.3 | 59.7 | 46.9 | 64.8 | ||||
| 소득계층 | 상 | 69.0 | 68.1 | 51.3 | 69.2 | 71.0 | |||
| 중 | 76.8 | 68.6 | 71.9 | 78.4 | 76.8 | ||||
| 하 | 83.2 | 86.7 | 86.4 | 83.6 | 80.5 | ||||
| 경제활동상태 | 상용직 | 80.0 | 76.8 | 81.7 | 80.3 | 80.6 | |||
| 임시, 일용직 | 82.2 | 81.5 | 85.0 | 83.0 | 80.9 | ||||
| 고용주, 자영업 | 71.7 | 77.2 | 72.7 | 72.1 | 69.2 | ||||
| 실업자 | 82.3 | 87.5 | 83.1 | 79.6 | 83.5 | ||||
| 비경제활동 | 81.5 | 85.0 | 84.3 | 82.2 | 79.2 | ||||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6).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를 기준 집단으로 하였을 때, 소득 하층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 없음과 있음 집단의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박탈 영역에서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이에 더해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6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 (단위: %) | |||||||||
|---|---|---|---|---|---|---|---|---|---|
| 구분 | 소득 상층 & 박탈 경험 없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없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지지체계 유형 | |||||
| 유형1 (모두 없음) | 유형2 (모두 없음) | 유형3 (모두 없음) | 유형4 (모두 없음) | ||||||
| 돌봄 | 68.1 | 81.5 | 87.4 | 91.1 | 86.6 | 87.6 | 86.0 | ||
| 주거 | 69.0 | 81.7 | 86.3 | 92.1 | 83.8 | 85.5 | 85.8 | ||
| 건강 | 69.4 | 81.3 | 87.1 | 88.8 | 86.7 | 86.7 | 86.9 | ||
| 교육 | 68.2 | 80.4 | 87.5 | 90.8 | 88.9 | 86.0 | 87.9 | ||
이러한 경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표 7, 그림 1). 청년은 돌봄 박탈 중 지지체계 유형2의 사례 수가 적었고, 노년층은 소득 하층이면서 돌봄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은 지지체계 유형별 사례 수가 모두 30명 이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와 건강 유형1(공적, 사적 지지체계 없음)과 유형4(공적, 사적 지지체계 있음)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은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가 박탈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거와 건강 박탈을 경험한 소득 하층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유형4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 박탈은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기중년과 후기중년은 비슷한 특성을 보였는데, 청년과 달리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유형4의 불안 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년층은 주거와 건강 박탈 영역에서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면서 박탈을 경험한 취약집단의 경우,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지지체계만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청년, 중년, 노년층 비교
| (단위: %) | |||||||||
|---|---|---|---|---|---|---|---|---|---|
| 구분 | 소득 상층& 박탈 경험 없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없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소득 하층 & 박탈 경험 있음 & 지지체계 유형 | |||||
| 유형1 (모두 없음) | 유형2 (모두 없음) | 유형3 (모두 없음) | 유형4 (모두 없음) | ||||||
| 청년 | 돌봄 | 76.2 | 87.9 | 91.5 | 91.5 | 95.9 | 88.3 | 92.5 | |
| 주거 | 77.4 | 87.5 | 88.9 | 93.2 | 89.1 | 90.0 | 93.5 | ||
| 건강 | 78.8 | 87.2 | 91.4 | 91.3 | 91.7 | 89.3 | 93.6 | ||
| 교육 | 77.4 | 87.1 | 90.3 | 95.2 | 93.9 | 87.9 | 90.0 | ||
| 초기중년 | 돌봄 | 72.8 | 85.5 | 87.7 | 92.0 | 91.4 | 87.6 | 84.5 | |
| 주거 | 73.8 | 86.6 | 86.0 | 92.9 | 82.5 | 84.1 | 87.1 | ||
| 건강 | 74.7 | 86.8 | 85.5 | 91.2 | 85.0 | 84.7 | 83.9 | ||
| 교육 | 72.1 | 86.1 | 86.7 | 89.0 | 88.6 | 84.8 | 87.2 | ||
| 후 | 돌봄 | 67.8 | 81.4 | 87.1 | 91.1 | 75.1 | 88.0 | 86.4 | |
| 기중년 | 주거 | 67.9 | 81.5 | 86.6 | 92.7 | 82.2 | 85.4 | 86.7 | |
| 건강 | 68.3 | 81.2 | 86.7 | 86.4 | 85.5 | 87.0 | 87.0 | ||
| 교육 | 68.3 | 81.7 | 85.5 | 87.9 | 79.8 | 85.6 | 85.2 | ||
| 노년 | 돌봄 | 54.0 | 63.9 | 66.4 | 68.2 | 68.2 | 51.6 | 67.5 | |
| 주거 | 52.7 | 61.5 | 72.3 | 67.3 | 79.1 | 49.2 | 72.9 | ||
| 건강 | 63.9 | 60.7 | 78.3 | 66.8 | 82.3 | 70.9 | 78.5 | ||
그림 1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주:
-
1)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
2) 청년층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의 유형2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노년층은 65-74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돌봄 박탈은 유형별 사례 수가 30명 이하이고, 주거와 건강은 유형1 과 유형3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통합자료.
3. 소득계층-박탈경험-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 인식 여부를 종속변수로, 지지체계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선형확률모형을 분석하였다(표 8).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이면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이 높았다. 소득계층만 투입한 모형1에서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 높았다. 세 가지 영역별 박탈 경험 여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 소득계층의 계수 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박탈 경험은 돌봄과 주거만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모형3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을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박탈 경험을 투입한 모형4에서 지지체계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가 사회적 위험(복지 욕구)을 반영하는 박탈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 구분 | 모형1 소득계층 | 모형2 박탈 경험 | 모형3 지지체계 | 모형4 통합모형 | |
|---|---|---|---|---|---|
|
|
|||||
| 성별 | 여성 | 0.08*** | 0.08*** | 0.08*** | 0.08*** |
| 연령집단 (청년) | 초기중년 | -0.02 | -0.03 | -0.02 | -0.02 |
| 후기중년 | -0.00 | -0.00 | -0.00 | -0.00 | |
| 노년 | -0.13*** | -0.12*** | -0.13** | -0.12* | |
| 1인가구(다인가구) | 0.00 | 0.00 | 0.00 | 0.00 | |
| 배우자 있음(없음) | 0.01 | 0.01 | 0.01 | 0.01 | |
| 건강함(건강하지 않음) | -0.04*** | -0.03*** | -0.04*** | -0.03*** | |
| 거주지역 | 수도권 | 0.02 | 0.02 | 0.02 | 0.02 |
| 교육 (중졸) | 고졸 | 0.02 | 0.02 | 0.02 | 0.02 |
| 대졸 이상 | 0.06* | 0.06* | 0.06* | 0.06* | |
| 경활상태 (상용직) | 임시 | 0.02 | 0.02 | 0.02 | 0.02 |
| 자영 | -0.01 | -0.01 | -0.01 | -0.01 | |
| 실업 | -0.01 | -0.01 | -0.01 | -0.01 | |
| 소득계층 (상) | 중 | 0.04*** | 0.04*** | 0.04** | 0.04*** |
| 하 | 0.04* | 0.04* | 0.04* | 0.05* | |
| 하 | 0.11*** | 0.10*** | 0.10*** | 0.10*** | |
| 박탈 경험 | 돌봄 | 0.03** | 0.03** | ||
| 주거 | 0.03** | 0.03* | |||
| 건강 | 0.01 | 0.01 | |||
| 지지체계 (모두 없음) | 공적 | 0.02 | 0.01 | ||
| 사적 | 0.02 | 0.02 | |||
| 모두 있음 | 0.03# | 0.03 | |||
|
|
|||||
| Constant | 0.88*** | 0.85*** | 0.78*** | 0.76*** | |
|
|
|||||
| 사례 수 | 7,692 | 7,692 | 7,692 | 7,692 | |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표 9).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령집단에 따라 지지체계 유형과 소득계층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별 모형을 마련해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원 변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1에서 지지체계와 소득계층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형2와 모형5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년의 경우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보다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불안 인식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 하층이 상층 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공적 지지체계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등 그간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된 준보편적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4) 한편, 초기중년과 후기중년은 소득계층과 지지체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중년층의 경우 공적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서 이로 인해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9
소득계층,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 구분 | 모형1 전체 | 모형2 청년 | 모형3 초기중년 | 모형4 후기중년 | 모형5 노년 | |
|---|---|---|---|---|---|---|
|
|
||||||
| 연령집단 (청년) | 초기중년 | -0.02 | ||||
| 후기중년 | -0.08*** | |||||
| 노년 | -0.23*** | |||||
| 소득계층 (상) | 중 | -0.03 | -0.32*** | 0.01 | 0.12 | -0.17 |
| 하 | 0.12 | -0.15*** | 0.05 | 0.35** | 0.16 | |
| 박탈 경험 | 돌봄 | 0.03** | 0.03 | 0.02 | 0.04* | -0.01 |
| 주거 | 0.03** | 0.02 | 0.01 | 0.02 | 0.08 | |
| 건강 | 0.01 | -0.02 | -0.01 | 0.03 | 0.12* | |
| 교육 | 0.03 | 0.01 | 0.01 | |||
| 지지체계 (모두 없음) | 공적 | -0.19 | -0.70*** | -0.1 | -0.01 | 0.38* |
| 사적 | 0.00 | -0.21*** | -0.08 | 0.20 | -0.07 | |
| 모두 있음 | 0.05 | -0.21** | -0.03 | 0.13 | 0.09 | |
| 소득 중층 x지지체계 | 공적 | 0.20 | 0.77*** | 0.11 | -0.09 | -0.47* |
| 사적 | 0.10 | 0.34*** | 0.08 | -0.05 | 0.21 | |
| 모두 있음 | 0.04 | 0.30** | 0.04 | -0.06 | 0.18 | |
| 소득 하층 x지지체계 | 공적 | 0.19 | 0.70*** | 0.12 | 0.00 | -0.48* |
| 사적 | -0.02 | 0.19** | 0.07 | -0.22 | -0.13 | |
| 모두 있음 | -0.06 | 0.19* | 0.02 | -0.19 | -0.14 | |
|
|
||||||
| Constant | 0.85*** | 0.72*** | 1.02*** | 0.64** | 0.80 | |
|
|
||||||
| 사례 수 | 7,692 | 1,793 | 2,183 | 2,716 | 1,000 | |
Ⅴ. 결론
이 연구는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포괄하는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연령집단별 지지체계의 특성, 사회적 불안의 격차와 계층화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계층 따른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에 따라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계층 상층보다 하층이 건강과 교육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지체계 유형도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체계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 하층이 공적 지지체계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연령 집단별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지체계를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였는데, 이 비율은 노년층이 5.6%로 가장 낮고, 청년(11.3%), 초기중년(11.7%), 후기중년(12.1%) 순이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연구에서 노년층의 고립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로, 도움을 받을 사람 유무로 측정한 사적 지지와 더불어 사회보장 급여 수급으로 측정한 공적지지를 포괄할 경우, 지지체계 결핍은 노년층이 아닌 청년 혹은 중년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적지지 혹은 사적지지만 있는 유형2와 유형3은 연령 집단별로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적지지만 있는 유형은 기존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년층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의 79.5%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안 인식은 청년이 84.7%로 가장 높았고, 초기중년(84.3%), 후기중년(78.4%), 노년층(59.3%) 순으로 높았다.5) 종합하면, 청년과 중년은 공적지지와 사적 지지 체계를 모두 포괄한 지지체계가 노년층보다 미흡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소득계층, 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층이 상층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득계층, 박탈 경험의 영향을 통제한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모든 박탈 영역에서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이에 더해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일부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청년층은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급여가 여전히 선별적이고, 대상 포괄성이 낮아 사회보장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청년의 불안수준이 매우 높거나, 사회보장급여만으로 불안 수준을 낮추기에 역부족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박탈 경험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소득계층-박탈 경험(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에서 지지체계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박탈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유형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계층을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적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확인한 공적 지지체계의 사회적 불안 완화 효과는 준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 격차를 고려할 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박탈 경험률 모두 소득 하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사적 지지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은 지지체계가 미흡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취약성이 큰 집단이 지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둘째, 공적 지지체계와 더불어 사적 지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사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집단은 사적 지지체계가 있는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특히,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유형 비중이 가장 낮았던 중년층은 사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 1인가구 증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의 전 세대로의 확장과 심화를 고려할 때, 사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 고립·은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취약청년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도 마련되고 있으나,6) 사회보장급여의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경직된 방식으로는 새로운 복지 욕구를 가진 새로운 복지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일상에 맞닿을 수 있는 촘촘한 지지체계를 만들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극단적인 빈곤과 장기적 은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지역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시민을 찾아서 복지지원을 연결하는 서울시 마음편의점 사업, 1인가구, 영유아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관계망 자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애과정을 고려한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 경험으로 측정한 공적 지지를 포함할 때 지지 체계의 결핍은 노년층보다 초기, 후기중년층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김성아와 노현주(2024)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수준은 회복됐지만, 중장년층의 고립은 더 심화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분절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령대 별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였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핵심 근로연령층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불안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운, 공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 불안은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서 삶의 불안도를 낮추고, 개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동과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보편적으로, 노인에게는 준보편적으로, 청년과 중장년에게는 선별적 방식을 적용해왔다. 전 생애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기반의 소득 보장제도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하고,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건강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를 포괄하여 지지체계를 유형화하고, 지지체계 유형헤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공적 지지체계는 사회보장제도 수급 경험으로, 사적 지지체계는 사회관계망 유무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사적 지지체계를 포괄하여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녕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 연구는 청년, 초기와 후기중년, 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공적, 사적 지지체계 유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생애주기별로 분절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횡단적 설문 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의 정의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지체계의 특성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 위를 변경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비율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0대와 20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50대와 60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통계청, 2025).
이현주 외(2023)는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과 제약, 그리고 통합자료의 검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연령과 시점이 다른 자료를 통합하였으므로, 조사 시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합하는 방식은 3개 시점 중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센서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가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3개 연도 센서스 평균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기준시점에 따라 다른 시점 사례의 연령을 변경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 특정 연령이 인식한 사회적 불안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령을 변경하는 전자의 방식이 아닌 연령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후자, 가상시점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하였다. 한편, 이현주 외(2023)는 사회적 불안에 관련한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횡단면 조사자료인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울, 행복 등 관련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22년은 2020년과 비교하여 불안 관련 인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년과 초기중년, 노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2022년 조사를 진행한 후기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이현주 외, 2023 . p.55).
19~34세 청년의 청년수당 수급 경험률은 6.6%에 불과하였는데, 65-74세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47.7%였다. <부표 1>은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선별적, 보편과 준보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선별적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 위지원이 포함된다. 청년층의 경우는 근로장려세제와 청년수당도 선별적 정책에 포함하였다. 보편-준보편적 정책에는 아동수당, 영유아보육지원이 포함되며, 주거지원, 취업 지원, 상담서비스 등 대상 기준 특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책은 제외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연금, 재정지원일자리를 보편-준보편 정책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선별적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보편-준보편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특히 노년층 중 선별적 지원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References
, & (2002). Welfare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in late life. Psychology and Aging, 17(2), 260. [PubMed]
, , & (1985).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ubsequent to an important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3), 247-263. [PubMed]
(2025). OECD BLI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community/
, & (2019). The differential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8(2), 107-126. [PubMed]
부록
부표 1.
청년층과 노년층의 공적지원 특성별 사회적 불안 인식
| (단위: %) | |||||||||
|---|---|---|---|---|---|---|---|---|---|
| 구분 | 전체 | 공적지지 특성 | |||||||
| 경험 없음 | 선별 | 보편 준보편 | 모두 경험 | ||||||
| 전체 | 76.7 | 74.9 | 89.7 | 70.6 | 85.8 | ||||
| 청년 | 76.7 | 82.7 | 89.1 | 83.9 | 87.4 | ||||
| 노년 | 59.2 | 47.6 | 94.2 | 62.4 | 65.8 |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6-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6-10

- 326Download
- 1211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