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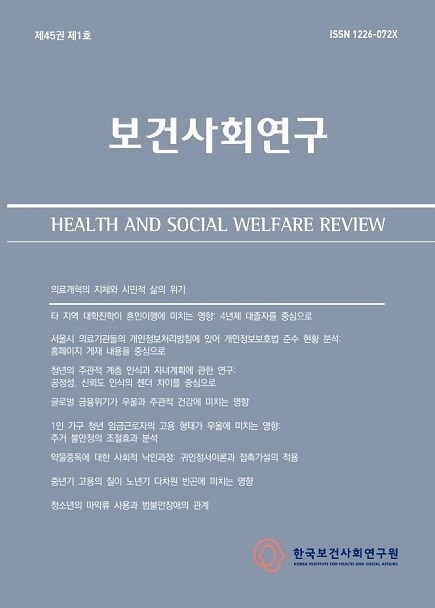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ong, Kupyo; Jeon, Hyeseo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34-67,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3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of thre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and important others’ support i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male and female freshmen to seniors at three universities, University A located in Seoul, University B in Gyeonggi-do and University C in Gangwon-do. Excluding the questionnaires of students who did not use an SNS or responded inadequately, 315 copies of data were used in a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a study of verification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SNS addiction tendency and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important others’ support were suggested as factors having significant impacts 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NS addiction tendency had a positive impact while family’s support, friends’ support and important others’ support had negative impact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amily’s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riends’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ourth, important others’ suppor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college students with SNS addiction tendency come to experience and for more practical intervention to strengthen and maintain social support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각각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A대학, 경기도 소재의 B대학, 강원도 소재의 C대학 총 3곳의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15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중독경향성 및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SNS중독경향성은 정적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친구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중요타인 지지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SNS중독경향성이 있는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위해 제언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된 SNS의 이용에는 필연적으로 서로 상반적인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 먼저 긍정적인 기능으로의 SNS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결의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반면, 순기능과는 반대로 다양한 역기능과 함께 SNS의 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홍신영, 2015). SNS의 중독은 대인 관계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관계중독(조성현, 서경현, 2013)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NS의 중독적 사용에서 이루어지는 대인접촉은 자신의 진면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스펙(Specification)으로 가공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본질적인 대인관계의 질과 친밀감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낮추어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거, 2013). 즉, SNS의 중독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구혜자, 이와선, 홍민주, 2016).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행동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Sullivan, 1956)하는 역기능적이고 반복적인 행동패턴을 말한다(Leary, 1957).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겪는 불안과 고통스러움을 피하고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만의 일정한 대인관계 패턴을 갖는다(Horowitz, 1979). 하지만 그 패턴이 부적응적으로 고착화될 때 대인관계문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문제는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억제 등의 하위개념 등으로 구성된다(최민경, 김종남, 2010). 이러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동반되는 고통은 고독감과 외로움, 열등감,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Zakahi & Duran, 1982; Argyle, 1984; Spitzberg & Canary, 1985; 김성회, 박경희, 2008; 최민경, 김종남, 2010). 또한 대인관계문제가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병리증상을 유발시 키게 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Horowitz & Vikus, 1986). 대학생이 이러한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될 경우, 대학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향후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포함한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미자, 2009;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사람인, 2015.05.18).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독립을 요구받으며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해가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자, 친밀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건강한 자아정체성감 확립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시기라고 말한다. 즉, 대학생은 청소년기의 가족과 또래라는 제한적인 관계에서 더 폭넓고 다양한 사회관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조은정, 2004), 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비해 성인초기에 접어드는 대학생은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권석만, 2006). 최근 서울시립대 · 경희대 · 한양대 · 경북대 등의 대학교에서 조사된 2014년까지의 개인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평균 24.2%의 증가율을 보였고, 주 호소문제에 대인관계문제가 지목되고 있을 만큼(주간경향, 2015.03.31)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권석만, 2006; 장석진, 2007).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대학생의 SNS의 이용에 따른 대인접촉 패턴 변화와 SNS의 지나친 사용에 따른 SNS중독경향 성이다. 최근 인터넷통신기술 등의 발달과 보급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가깝게 연결시키는 초연결성 사회를 탄생시키고 있다(정하웅, 2015). 이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연결의 욕구’를(나은영, 2012) 보다 쉽고 간편하게 충족시켜 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일으켰다(김민정, 2011). SNS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및 동료 등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여 폭넓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의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즉 SNS는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제공하도록 IT기술을 접목시켜(정기한, 정지희, 신재익, 2010)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던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인맥관리 기능을 인터넷 접속과 클릭만으로 신속한 정보전달, 개인관심사 공유, 정보의 개방 등의 특징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가능하도록 해주었다(오 승석, 2010).
친밀한 대인관계를 발달과업으로 두고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반응 등에 민감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대학생에게(박미향, 2014) 이와 같은 순기능을 가진 SNS는 거부 할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인 대인접촉 매개체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이용자의 64.9%가 SNS이용자이며, 10명 중 7명(77.2%)은 ‘친교/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계청(2016)의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SNS의 이용은 대학생(91.0%), 고등학생(79.3%), 중학생(73.1%) 순으로 대학생의 사용이 가장 높았고, 주당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은 20대 21.0시간, 10대 14.3시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 SNS의 사용에는 쉽고 편리한 인맥관리 및 정보공유라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반면, SNS의 과다이용 및 중독경향성은 정보의 오남용, 사생활 침해, 오프라인 대화의 단절, SNS중독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인다(우공선, 2011).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3억 5000만 명이나 과다사용으로 인한 SNS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Sickfacebook, 2010)와 함께 사회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중독(Facebook Twitter Addiction Disorder, FTAD)과 같은 신조어까지 탄생시킬 지경에 이르렀다(Young, 2011). 이러한 SNS의 과다이용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SNS중독경향성을 더 높여준다(피승정, 2013). 국내 75.4%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스마트폰 중독자의 77%가 중독의 주된 원인으로 SNS를 지목한 점과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군이 2011년을 기준으로 8.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4.2%로 나타난 점(미래창조과학부, 2015)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SNS의 과다 사용 및 중독 경향성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문제이다(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3). SNS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반면, 가족 과 친구 등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게 해서 대인관계의 깊이 및 관계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피승정, 2013). 이러한 SNS 중독경향성은 선택적인 관계 맺기, 대인관계 갈등 회피(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2011), 현실 속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줄여 소외감 강화 등(송혜진, 2011; 오윤경, 2012) 낮은 대인관계 만족감을 초래하고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서거, 2013)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응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최현석, 하정철, 2011). 결과적으로 SNS중독경향성은 개인에게 우울과 외로움을 유발시키고 낮은 대인관계 만족감을 초래한다(오윤경, 2012; Donelly & Kuss, 2016). 사람들은 심리적인 외로움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SNS를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이 때 경험하는 ‘사회적’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삶에서의 대인관계 질과 친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Weiser, 2001; Henry, 2007; Raacke & Bonds, 2008). 즉,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SNS가(강미은, 2000; 권상희, 우지수, 2005; 오유경, 2012; 최민재, 김위근, 2013) 사용자의 중독적인 과다 사용으로 주변 대인관계를 손상시켜서 결국은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최현석, 하정철, 2011).
이러한 SNS 중독경향성이 갖는 문제는 인터넷 중독이 갖는 문제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소외 문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대인관계문제 및 사회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우정연, 2007), 이들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낮고 사회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수준도 더 높아 대인관계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 2010).
한편, SNS사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SNS의 이용이 오히려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강민주, 2013; 한나라, 2013; 김종기, 한지연, 2014). 이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온라인 접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도 이들과 접촉하고 관계형성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인관계에 만족감을 높이고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 유진, 김휘재, 2005).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SNS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대안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써(Cohen & Hoberman, 1983)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Sarason & Levine, 1983). 즉,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인관계적인 거래로 정의되며,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적 지지를 동일 시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희연, 2010).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정인아(1993)의 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가 순응적이고 협조적인 대인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불신적이고 반항적인 대인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신노라, 안창일(2004)의 연구에 서도 애착과 대인불안의 변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대인불안은 감소된다고 하였다(김지영, 2015).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지지원으로는 가족, 친구 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심미경, 1986; 김수민, 1987; Buhrmester & Furman, 1987; Furman & Buhrmester, 1992),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다른 지지원으로는 교사, 은사, 선배, 스승, 상관, 전문가 등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House, 1981; 박지원, 1985). 이처럼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지지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중요한 지지원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에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모든 타인을 포함하는 중요타인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가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SNS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SNS중독경향성을 갖게 하는 영향요인들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주요 선행연구들은 자기조절, 외로움, 불안, 자존감, 내현적 ·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 같은 등과 같은 개인심리적 요인들이 SNS중독경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제시하였다(강지혜, 2014; 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2014; 박나리, 2015; 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Ebesutani, 조인성, 2015; Xu & Haridakis, 2015; 유나, 2016;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그 외에도 정신건강요인(강예원, 2014)에 주목하거나, 학업정서,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문제, 사회연결망, 사회적 지지(김보경, 2014; 김정화, 2015; 이선희, 2015; 전해옥, 2016; 최다희, 2016)등의 요인들이 SNS의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해왔다.
반면, SNS중독이 초래하는 부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Meena, Soni, Jain과 Paliwal(2015)의 연구에서는 SNS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Jafri(2015)의 연구에서는 SNS중독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현주와 김혜경(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SNS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인숙, 조주연, 2012)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SNS과다 사용이 가져오는 부적응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여서 SNS의 중독경향성이 대학생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지는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특히, SNS중독경향성을 가진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변인으로써의 사회적 지지를 적용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지지유형에 따라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각각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NS중독경향성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각각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NS중독경향성이 있는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가족과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중요타인지지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을 통하여 서울 소재의 A대학, 경기도 소재의 B대학, 강원도 소재의 C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 2, 3, 4학년들 중 총 356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실시 방법 및 유의사항을 배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 각자 소속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배포자 및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여 356부(100%)가 회수되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41부를 제외한 총 31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가.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척도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가 대인 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검사를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이 단축하여 재구성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대인관계문제검사(KIIP-SC) 척도는 비주장성(HI, 주장성, 자신감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과순응성(JK, 독립성을 유지가 힘들며, 쉽게 이용 및 설득 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기희생(LM, 지나치게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며 책임을 지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과관여(NO,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통제지배(PA, 타인을 통제 및 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기중심성(BC, 지나친 자기 자신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냉담(DE,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사회적억제(FG,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40문항 구성되어 있다.
설문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최소 40점에서 최대 200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비주장성 .85, 과순응성 .79, 자기희생 .73, 과관여 .75, 통제지배 .73, 자기중심성 .78, 냉담 .82, 사회적억제 .83으로 나타났다.
나. SNS중독경향성
SNS중독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개발은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윤경(2012)이 SNS중독경향성 측정을 위해 인터넷 중독 척도를 수정 및 개발한 SNS중독경향성 척도 11문항에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SNS 일반 이용자와 과다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을 실시한 후, 중독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9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에 오윤경(2012)이 수정 및 개발한 척도에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3개의 하위요인을 구인 타당도를 통해 추출하였다. 각 하위요인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10문항)이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7문항)이 .86,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3문항)가 .78로 나타났으며, 총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에서는 .94로 나타났다(조성현, 서경현, 2013). 총 20문항으로 설문형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u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는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에 의하여 개발된 다차원 척도이다. MSPSS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중요한 타인(4문항)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인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하위척도 중 중요한 타인 차원에는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교수, 멘토 등 대학생에게 영향력 있는 타인으로 생각되는 모든 지지원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문항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의지할 수 있다’, ‘정말로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옥선(2000)이 사용한 것을 박소현(2008)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소현(2008)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을 보면, 가족지지 .80, 친구지지 .85, 중요한 타인지지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은 가족지지 .86, 친구지지 .86, 중요한 타인지지 .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SNS이용현황, 주요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SNS중독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m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이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대학생들이다.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31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356부를 배부하여 356부(100%)를 회수하였다. 그 중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부를 제외한 315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문 참여자는 남성이 145명(46.0%), 여성은 170명(54.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각 학년별로는 2학년이 110명(34.9%), 1학년이 107명(34.0%), 4학년이 59명(18.7%), 3학년이 39명(12.4%)으로 조사되어 1, 2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다소 높은 설문 참여율을 보여 주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N=315) | |||
|---|---|---|---|
| 특성 | 구분 | 빈도수(명) | 비율(%) |
| 성별 | 남자 | 145 | 46.0% |
| 여자 | 170 | 54.0% | |
| 학년 | 1학년 | 107 | 34.0% |
| 2학년 | 110 | 34.9% | |
| 3학년 | 39 | 12.4% | |
| 4학년 | 59 | 18.7% | |
나. SNS이용현황
대학생들의 SNS이용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루 사용시간, 접속률, 글 게시 빈도, 인맥, SNS로만 유지되는 인맥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SNS이용현황
| 특성 | 구분 | 빈도수(명) | 비율(%) |
|---|---|---|---|
| SNS 하루 이용시간 | 30분 미만 | 78 | 24.8% |
| 1시간 | 108 | 34.3% | |
| 2시간 | 84 | 26.7% | |
| 3시간 | 38 | 12.1% | |
| 4시간 | 7 | 2.2% | |
| SNS접속률 | 매일 | 229 | 72.7% |
| 주 5회 이상 | 37 | 11.7% | |
| 주 3회 이상 | 23 | 7.3% | |
| 주 1회 이상 | 9 | 2.9% | |
| 한 달에 한 번 이상 | 4 | 1.3% | |
| 거의 접속하지 않음 | 13 | 4.1% | |
| SNS 글 게시 빈도 | 거의 하지 않는다 | 175 | 55.6% |
| 1달에 1~2번 | 81 | 25.7% | |
| 1주일에 1~2번 | 41 | 13.0% | |
| 1주일에 3~4번 | 9 | 2.9% | |
| 하루에 1~2번 | 5 | 1.6% | |
| 하루에 3번 이상 | 4 | 1.3% | |
| SNS 인맥 | 10명 내외 | 9 | 2.9% |
| 20명 내외 | 13 | 4.1% | |
| 30명 내외 | 11 | 3.5% | |
| 50명 내외 | 25 | 7.9% | |
| 100명 내외 | 257 | 81.6% | |
| SNS로만 유지되는 인맥 | 없다 | 21 | 6.7% |
| 소수 | 66 | 21.0% | |
| 반 정도 | 91 | 28.9% | |
| 반 이상 | 82 | 26.0% | |
| 대부분 | 55 | 17.5% |
먼저, SNS의 하루 이용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108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2시간’이 84명(26.7%), ‘30분 미만’이 78명(24.8%), ‘3시간’이 38명 (12.1%), ‘4시간’이 7명(2.2%) 순으로 나타났다.
SNS접속률은 ‘매일’이 229명(7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5회 이상’이 37 명(11.7%), ‘주 3회 이상’이 23명(7.3%), ‘주 1회 이상’이 9명(2.9%),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4명(1.3%)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매일 SNS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75명(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달에 1~2번’이 81명(25.7%), ‘1주일에 1~2번’이 41명(13.0%), ‘1주일에 3~4번’이 9명(2.9%), ‘하루에 1~2번’이 5명(1.6%), ‘하루에 3번 이상’이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SNS에서 맺고 있는 인맥의 정도를 살펴보면, ‘100명 내외’가 257명 (81.6%)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명 내외’가 25명(7.9%), ‘20명 내외’가 13명(4.1%), ‘30명 내외’가 11명(3.5%), ‘10명 내외’가 9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인맥 중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고 주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반정도’라는 응답자가 91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 이상’이 82명(26.0%), ‘소수’가 66명(21.0%), ‘대부분’이 55명(17.5%), ‘없다’가 2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수준
SNS중독경향성의 수준에 따라 3개(상, 중, 하)의 집단을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SNS중독경향성 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 구분 | 빈도수(명) | 비율(%) | |
|---|---|---|---|
| SNS중독경향성 수준 | 하 | 56 | 17.8 |
| 중 | 218 | 69.2 | |
| 상 | 41 | 13.0 | |
| 합계 | 315 | 100 |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SNS중독경향성 척도의 경우, 집단 구분을 위한 절단점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을 ‘하’로, +1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을 ‘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SNS중독경향성 ‘하’ 집단이 56명(17.8%), ‘중’ 집단이 218명(69.2%), ‘상’ 집단이 41명(13.0%)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표 4>와 같다. 변인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는 평균 2.26점(5점 만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SNS중독 경향성은 평균 1.84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평균 3.80(5점 만점)으로 나타나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평균 3.93점(5점 만점)으로 ‘그렇다’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는 평균 4.00점(5점 만점)으로 ‘그렇다’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타인지지는 평균 3.45점 (5점 만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M | SD |
|---|---|---|---|---|
| 대인관계문제 | 1.00 | 3.73 | 2.26 | .54 |
| SNS중독경향성 | 1.00 | 3.55 | 1.84 | .48 |
| 사회적 지지 | 1.33 | 5.00 | 3.80 | .67 |
| 가족지지 | 1.25 | 5.00 | 3.93 | .81 |
| 친구지지 | 1.25 | 5.00 | 4.00 | .74 |
| 중요타인지지 | 1.00 | 5.00 | 3.45 | .94 |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문제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실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변인 | SNS중독경향성 | 사회적 지지 | 가족지지 | 친구지지 | 중요타인지지 | 대인관계문제 |
|---|---|---|---|---|---|---|
| SNS중독경향성 | 1 | |||||
| 사회적 지지 | -.253** | 1 | ||||
| 가족지지 | -.207** | .820** | 1 | |||
| 친구지지 | -.230** | .796** | .579** | 1 | ||
| 중요타인지지 | -.180** | .796** | .430** | .412** | 1 | |
| 대인관계문제 | .577** | -.654** | -.538** | -.507** | -.531** | 1 |
먼저 SNS중독경향성과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r= -.253, p<.01), 가족지지(r= -.207, p<.01), 친구지지(r= -.230, p<.01), 중요타인지지(r= -.180, p<.01)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r= 577, p<.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와 대인관 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r= -.654, p<.01), 가족지지(r= -.538, p<.01), 친구지지(r= -.507, p<.01), 중요타인지지(r= -.531, p<.01)로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 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SE | β | t | p |
|---|---|---|---|---|---|
| SNS중독경향성 | 상수 | .100 | 10.539 | .000 | |
| 대인관계문제 | .053 | .577 | 12.507 | .000 | |
| R² = .333, 수정된 R² = 331, F = 156.417, p = .000 |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결과, t값은 10.539(p = .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 = .000에서 156.41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333로 3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5.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단계3에서 SNS중독경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7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R² | ΔR² | ΔF |
|---|---|---|---|---|---|---|---|---|
| 1 | SNS중독경향성 | .657 | .053 | .577 | 12.507*** | .333 | .333 | 156.417*** |
| 2 | SNS중독경향성 | .554 | .046 | .487 | 12.104*** | .517 | .184 | 118.562*** |
| 가족지지 | -.294 | .027 | -.438 | -10.889*** | ||||
| 3 | SNS중독경향성 | .567 | .046 | .498 | 12.409*** | .527 | .010 | 6.369* |
| 가족지지 | -.291 | .027 | -.433 | -10.859*** | ||||
| SNS중독경향성 X 가족지지 |
.132 | .052 | .099 | 2.524* |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333으로, SNS중독경향성 (β= .557, p<.001)은 대인관계문제의 변량을 33.3%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156.417,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가족 지지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0.517로 SNS중독경향성(β= .487, p<.001)과 가족지지(β= -.438, p<.001)는 대인관계문제를 51.7%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 118.562, p<.001). 3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SNS중독경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R²의 값은 .527로 SNS중독경향성(β= .498, p<.001)과 가족지지(β=-.433, p<.001), 그리고 SNS중독경향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β= .099, p<.05)은 대인관계문제를 52.7%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ΔF= 6.369, p<.05).
따라서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se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1)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회귀방정식의 Z값에 조절변인의 최대값으로 가족지지의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값을 넣고, 최소값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값을 넣어 가족지지 수준의 높고(고) 낮은(저) 집단을 설정하였으며, X값으로는 예측변인인 SNS중독경향성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한 값을 넣어 종속변수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서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가족 지지가 낮을 경우 기울기는 B(비표준화 계수)= .46으로 가족지지가 높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수)= .67 보다 약 1.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변화가 좀 더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족지지가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6.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 지의 조절효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단계3에서 SNS중독경향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8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R² | ΔR² | ΔF |
|---|---|---|---|---|---|---|---|---|
| 1 | SNS중독경향성 | .657 | .053 | .577 | 12.507*** | .333 | .333 | 156.417*** |
| 2 | SNS중독경향성 | .554 | .048 | .486 | 11.602*** | .481 | .148 | 88.643*** |
| 친구지지 | -.291 | .031 | -.395 | -9.415*** | ||||
| 3 | SNS중독경향성 | .590 | .050 | .519 | 11.746*** | .489 | .008 | 4.872* |
| 친구지지 | -.282 | .031 | -.383 | -9.123*** | ||||
| SNS중독경향성 X 친구지지 |
.119 | .054 | .095 | 2.207* |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333으로, SNS중독경향성 (β= .557, p<.001)은 대인관계문제의 변량을 33.3%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 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 156.417,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친구 지지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0.481로 SNS중독경향성(β= .486, p<.001)과 친구지지(β=-.395, p<.001)는 대인관계문제를 48.1%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 88.643, p<.001). 3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SNS중독경향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R²의 값은 .489로 SNS중독경향성(β= .519, p<.001)과 친구지지(β= -.383, p<.001), 그리고 SNS중독경향성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항(β= .095, p<.05)은 대인관계문제를 48.9%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ΔF= 4.872, p<.05).
따라서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se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2)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회귀방정식의 Z값에 조절변인의 최대값으로 친구지지의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값을 넣고, 최소값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값을 넣어 친구지지 수준의 높고(고) 낮은(저) 집단을 설정하였으며, X값으로는 예측변인인 SNS중독경향성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한 값을 넣어 종속변수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3]에서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는 친구지지가 낮을 경우 기울기는 B(비표준화 계수)= .50으로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수)= .68 보다 약 1.4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즉, 친구지지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변화가 좀 더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친구지지가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7.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중요타인지지의 조절효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333으로, SNS중독경향성(β= .557, p<.001)은 대인관계문제의 변량을 33.3%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 156.417,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중요타 인지지를 투입한 결과를 보면 R²의 값은 .521로 SNS중독경향성(β= .498, p<.001)과 중요타인지지(β= -.441, p<.001)는 대인관계문제를 52.1%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ΔF= 122.627, p<.001). 하지만 마지막 SNS 중독경향성과 중요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3단계에서 SNS중독경 향성과 중요타인지지의 상호작용항(β= .058, p>.05)은 종속변수인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타인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중요타인지지는 교수, 멘토 등의 가족 및 친구 외의 중요한 타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유추해보다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중요한 타인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한 데에는, 먼저 이들을 가족 및 친구처럼 명확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접촉 빈도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구처럼 교류가 많기 어렵고 필요할 때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타인이 중재효과를 갖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9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중요타인지지의 조절효과
| 단계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R² | ΔR² | ΔF |
|---|---|---|---|---|---|---|---|---|
| 1 | SNS중독경향성 | .657 | .053 | .577 | 12.507*** | .333 | .333 | 156.417*** |
| 2 | SNS중독경향성 | .567 | .045 | .498 | 12.501*** | .521 | .188 | 122.627*** |
| 중요타인지지 | -.254 | .023 | -.441 | -11.074*** | ||||
| 3 | SNS중독경향성 | .575 | .046 | .505 | 12.611*** | .525 | .003 | 2.170 |
| 중요타인지지 | -.250 | .023 | -.435 | -10.868*** | ||||
| SNS중독경향성 X 중요타인지지 |
.066 | .045 | .058 | 1.473 |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지지 각각의 요인들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하여 3개의 지역에서 3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3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구혜자, 이외선, 홍민주(2016)의 연구결과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에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오윤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페이스북 및 기타 SNS의 과다사용이 사용자의 낮은 자존감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Barker, 2009)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SNS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주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결의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가진 것이 분명함에도, SNS를 통한 대인접촉이 본질적인 대인관계의 질과 친밀감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기능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대학생에게서 SNS의 과다이용으로 나타나는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가족지지가 대인관계문제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대학생의 발달시기적 특성상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분화 및 분리를 시도하며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고자 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그 설명력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가족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향상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자원(Rook, 1984)으로 대인불안, 사회불안을 낮추어 준다는 선행연구들(신노라, 안창일, 2004; 홍누리, 안귀여루, 2014)과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능성을 높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돕는다는 선행연구(Spitzberg & Cupach, 198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유영주(1992) 는 가족의 기능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사랑과 성의 기능, 출산과 양육의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화 교육의 기능, 정서적 지지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사회화 교육 및 정서적 지지 기능이 가족 구성원들을 사회의 개별적인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Furman와 Buhrmester(1985)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부모이며, 한 개인이 사회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결시키는 대인관계 기술의 연마는 가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최혜련, 2004).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간관계의 근본을 가족에 두고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가족환경 변인의 영향은 크다(박영신, 김의철, 2002). 따라서 가장 높은 SNS 이용률을 보이는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를 악화시키지만, 가족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경험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늘려나간다면 대인관계문제를 완충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족이 가족지지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친밀감과 지지적인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족 패턴과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 이용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주로 단문메시지 형태로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높은 갈등해결능력에는 미흡할 수 있다. 이에 가족 간의 긍정적 정서기반의 대화와 상호소통을 통해,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상호적응 방식을 학습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는 증가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결혼 평균연령이 지연되는 만혼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진다. 대학생이 가족으 로부터는 건강한 독립을,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실질적 이고 기능적인 지지 또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는 지지적인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가족지지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친구지지 가 대인관계문제를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친구지지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음에도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발달시기적 특성상, 중고교 때인 청소년기에 또래집 단의 영향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것과는 달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형성에 더 높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친구지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의 지지가 독립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논문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친구관계는 가족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구별되는 자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작이며, 친구는 가족에게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한미현, 1996). 친구라는 관계는 가족과는 다르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관계로, 친구들끼리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집단에서 소속감을 제공해준다. 또한, 친구관계를 맺고 공동생활을 통해 대인 접촉을 배우고 자신의 적대심, 지배욕을 대인관계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배워감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고경필, 심미영, 2015). 따라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험되는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 계문제를 낮추어주는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중재적 대안을 제안하자면, 대학 내에서는 친구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집단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생들은 SNS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관계 맺는 행위’ 자체를 경쟁으로 여기면서 질적인 관계보다 양적인 관계형성에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로감으로 관계를 단절한 ‘나홀로’ 문화를 선택하고 즐기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내 또래들과의 집단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확대운영을 통해, 경쟁이 아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와 친밀감 등의 서로 간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중요타인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요타인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타인지지는 교수, 멘토 등으로 가족 및 친구를 제외한 영향력 있는 중요한 타인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중요 타인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한 데에는 이들이 가족 및 친구처럼 명확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측면, 접촉 빈도 및 소통의 원활함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구처럼 교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한계에 기반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확률적 편의표집 문제 및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대상의 대학생들은 서울, 경기, 강원에 소재한 각 1곳의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과학적인 표집방법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타인 영역에서 척도 관련 문제가 중요 한 타인이 가질 수 있는 조절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재정의가 요구된다. ‘중요타인 지지’에 대해 단순히 가족과 친구 외 교수 및 맨토 등의 주요 타인이라는 기존의 개념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다시 재고해서 적용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검증과정에서 이원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단정적으로 확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과학적 표집방법을 확충하여 재차 반복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SNS중독경향성 척도의 경우, 중독수준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절단점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SNS중독경향성 수준에 따른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및 인터넷 중독 척도와는 다르게 SNS중독경 향성 척도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 척도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합의된 절단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http://www.msip.go.kr/ 에서2016.5.29.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
. (2015). 자발적 아싸 경험자 63%,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 느껴. http://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26980 에서 2016.5.7. 인출. .
. 2015.03.24, 똑똑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요”,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3241318071, 에서 2016.4.29. 인출 .
. (2016). 2016년 청소년통계, http://kostat.go.kr/에서 2016.6.16. 인출 .
. (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http://www.kisa.or.kr/main.jsp에서 2016.5.3. 인출 .
(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2(2), 209-213. [PubMed]
, &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PubMed]
, &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PubMed]
, & (2008). My Space and Facebook: Apply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o Exploring Friend-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169-174. [PubMed]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1108. [PubMed]
(2010). 350 million people are suffering from Facebook Addiction Disorder (FAD), http://sickfacebook.com/350million-people-suffering-facebookaddiction-disorder-fad/에서 2016.4.9. 인출 .
, &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PubMed]
(2011.10.27). Addiction Disorder?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 2009. [on-line] http://www.netaddiction.com/index.php?option=com_blog&view=comments&pid=5&Itemid=0에서2016.3.21. 인출. . PA, USA: Bradfor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6-10-28
- 수정일Revised Date
- 2016-12-1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6-12-26

- 24953Download
- 3304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