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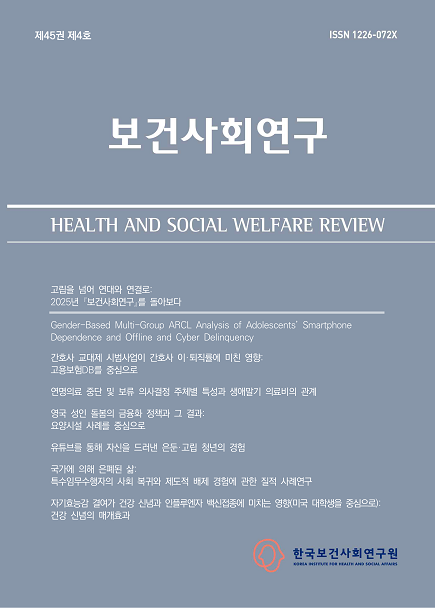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a Social Stigma Scale toward Suicidal People
An, Soontae*; Lee, Hannah
보건사회연구, Vol.37, No.2, pp.325-357, June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32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social stigma toward suicidal people. Suicide stigma is an important issue for suicide prevention,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systematic efforts to measure the stigmatic social perceptions about suicid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suicide stigma scale reflecting the culture and values of Korean society. After compiling exploratory ite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n in-depth survey, we first extracted distinctive factors with a survey of 164 adults. Then, based on another survey of 510 adults, we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yielded 7-factors with 46 items :‘Incompetence,’ ‘Personality,’ ‘Immorality,’ ‘Selfishness,’ ‘Glorification,’ ‘Sympathy,’ and ‘Social Exclusion.’ The subscales of each dimen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nal reliabilities. The convergent validity was also confirmed by i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Scale of Public Attitudes about Suicide, Stigma of Suicide Scale, and Stigma of Suicide Attempt.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systematically measure suicide stigma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a better understanding of suicide stigma reflecting the Korean culture will help us develop effective message strategies to reduce stigma in Korean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살 낙인은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이지만,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가 반영된 자살 낙인 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 문헌 연구와 일반인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항목을 구성하고, 일반 성인남녀 164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항목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무능력’, ‘기질’, ‘부도덕성’, ‘연민’, ‘이기주의’, ‘찬미’, ‘사회적 배제’의 7가지 차원으로 46개 항목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모두 유의미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기존 척도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한국 사회의 자살 낙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자살 시도자를 향한 낙인의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낙인 감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자살 낙인(stigma)은 자살 예방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다(WHO, 201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Batterham, Calear, & Christensen, 2012; Domino, 2005). 심적으로 나약하거나 결함 있는 사람이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인식은 자살 시도자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낙인으로 작용하여, 차별과 배척을 일으킨다. 러드와 동료들(Rudd et al., 2013)은 자살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낮다는 점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자살 위기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홀로 해결하고자 한다(Chan, Batterham, Christensen, & Galletly, 2014; Eagles, Carson, Begg, & Naji, 2003).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2014)는 자살 예방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살 낙인이 감소해야 함을 권고한다.
한국 사회에도 자살을 둘러싼 낙인이 존재한다.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에 따르면(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 허약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 이상이었다(보건복지부, 2014). 더욱이 자살 위기자들을 위해 일하는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정책 결정자들조차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김혜진 등, 2015; 이원영 등, 2013). 그럼에도 국내 자살예방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2005, 2008)은 낙인 감소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자살에 관한 사회적 낙인 개선을 통해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Dumsil & Verger, 2009; Mann et al., 2005).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살 낙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자살 낙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 박종익과 김영주(2011), 이원영과 동료들(2013)이 자살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자살 낙인보다 특정 집단의 태도 조사에 목적을 두고 있고, 서구권에서 개발된 척도는 국내상황에 적용하기에 문화적 제한점이 따른다. 낙인은 특정 사회의 문화적 인식이 반영된 규범으로(Goffman, 1963), 낙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Pescosolido et al., 2008). 최근 호주(Batterham et al., 2013)와 미국(Corrigan et al., 2017)에서 자살 낙인 척도가 발표되긴 했지만, 이들 척도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에,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워커와 동료들(Walker, Lester, Joe, 2006) 및 도미노와 동료들(Domino, Su, Shen, 2000)은 국가와 문화마다 자살을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 자살 낙인 척도의 개발은 국내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제이다. 또한, 서구권에서 개발된 낙인 척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 간 유사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 낙인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낙인을 탐색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자살 인식은 매우 다면적이고 우리 사회 고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행된 전략들은 선진국 모형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들은 제한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살 낙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이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문헌검토
1.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개념과 구성 요인
사회는 개인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공통된 집단적 신념(belief)을 공유하는데, 낙인(stigma)은 이러한 집단 가치에 대조되는 대상이 지니는 특성이다(Stafford & Scott, 1986). 낙인화(stigmatization)의 대상에게는 언어적인 라벨링(labelling)이 부여되며, 이는 낙인 집단과 정상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Link & Phelan, 2001). 낙인 집단은 정확한 지식이 아닌 고정관념화된 시선으로 평가되는데, 이로 인해 낙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은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대상으로 간주된다(Corrigan & Penn, 1999).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낙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잃고, 차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Link & Phelan, 2006).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한 낙인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선택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오래 전부터 자살은 그 원인인 병적인 측면보다 인간이 지켜야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Joiner, 2007). 이러한 낙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Tadros & Jolley, 2001), 자살을 선택한 사람을 정상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Calear et al., 2014; Rudd et al., 2013). 자살 시도자가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차별적 행동이 나타남을 보여준 결과(Lester & Walker, 2006)는 낙인화의 대상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살 낙인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찾기 위해선, 자살 낙인을 구성하는 차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불완전한 지식 구조와 감정적 반응이 혼합되어 있는 낙인은 낙인화의 원인이 되는 속성의 귀인 오류가 주된 신호(signal)로 작동한다(Corrigan, 2000). 자살 낙인 역시 자살의 발생 원인이나 자살 시도자의 기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은 ‘게으른’, ‘부도덕한’, ‘어리석은’, ‘무책임한’ 등의 낙인이 자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비슷하게, 코리건과 동료들(Corrigan et al., 2017)은 자살하는 사람을 향해 ‘겁쟁이’, ‘실패자’, ‘나약함’, ‘불신’ 등의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스코코와 동료들(Scocco et al., 2012), 박과 동료들(Park et al., 2015)은 ‘아이를 맡길 수 없다’, ‘고용할 수 없다’ 등과 같은 차별 행동을 자살 낙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자살 낙인은 자살에 대한 편견, 태도, 자살 시도자를 향한 차별 등과 혼용되어 있으며, 확실한 개념화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Batterham et al., 2013). 특정 대상을 일반적인 집단 범주에서 구분하고, 가치 절하된(devaluing) 정체성을 부여하는 낙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의 인지적, 감정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Phelan, Link, & Dovidio, 2008). 링크와 펠렌(Link & Phelan, 2001)은 낙인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정관념, ‘우리’와 ‘그들’이라는 집단 구분, 지위 상실과 차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코리건(Corrigan, 2000)은 낙인화된 대상을 향한 불완전한 지식 구조와 분노・공포・동정과 같은 감정적 반응이 함께 작용하여, 회피・거절의 차별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의 작동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편, 낙인화된 집단을 향한 왜곡된 지식을 의미하는 고정관념, 감정적 반응을 내포하는 편견, 행동적 반응을 지시하는 차별은 낙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개별적인 개념만으로는 낙인이 지닌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Phelan et al., 2008). 비록 태도(attitude)의 개념에는 낙인과 유사하게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단적 규범이 반영되어 형성된 낙인과 달리, 태도는 좀 더 개인적 수준의 판단이다(Rosenberg & Hoveland, 1960).
무엇보다, 낙인은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정체성으로, 낙인을 발생하는 행동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향한다(Goffman, 1963). 즉, 자살에 대한 낙인은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아닌, 자살을 시도하거나 선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평가이다. 또한, 낙인은 특정 사회가 구성하고 만들어낸 산물로서, 사회적 낙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인을 찍는 인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Link & Phelan, 2001).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향한 낙인보다 자살이라는 행동을 향한 태도에 관심을 가져왔다(Ghashemi et al., 2015; Kodaka et al., 2011). 또한, 일반인보다 자살 생존자, 유가족,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 등 특정 대상이 느끼는 자살 낙인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다(Botega et al., 2005; Jenner & Niesing, 2000; Kodaka et al., 2011).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 낙인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WHO, 201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살 낙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기존 개념들(Corrigan 2000; Goffman, 1963; Link & Phelan, 2001)을 참고하여, 자살 낙인을 ‘자살을 시도하거나 선택한 사람들의 자질이나 특성’으로 정의하고, 한국 사회의 자살 낙인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자살 낙인 관련 기존 척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자살 낙인 측정 도구는 자살에 대한 태도 척도에 기반을 둔다. 도미노와 동료들(Domino et al., 1982)은 자살을 향한 지역 사회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살 의견 설문지(Suicide Opin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약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허용성・정신질환/도덕적 질환・종교・위험・인구학적 측면・노화・동기・복수・감각추구 등의 15개 차원을 설명한다. 디에크스트라와 케르코프 (Diekstra & Kerkhof, 1988)는 기존의 도미도와 동료들(Domino et al., 1982)이 개발한 척도를 보완하여, 약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살에 대한 태도(Suicide Attitude Questionnaire, SUIATT) 척도를 발표했다. 태도의 구성 요인을 인지적, 감정적, 도구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사회구조적 원인・관계적 원인・겁쟁이/용감한・이성적/비정상 등의 16개 차원으로 자살을 향한 태도를 구분했다.
한편, 렌버그와 제이콥스(Renberg & Jacobbson, 2003)는 자살에 대한 태도가 자살할 권리・예방 가능성・낙인・정상/일반적・자살 발생 과정 등의 10가지 요인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척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태도의 하부요인으로 자살에 대한 낙인이 추가된 점이다. 여기에는 ‘자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척도에서 다루어진 낙인은 은폐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선택한 사람들을 향한 다양한 차원을 의미하는 낙인으로 보기엔 범위가 제한적이다.
일반인들의 자살 낙인을 조사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은 자살 태도 척도가 자살 낙인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기존 척도 중에서 자살 낙인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 및 타당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낙인・고립・찬미라는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코리건과 동료들(Corrigan et al., 2017)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Sheehan et al., 2016)를 바탕으로 자살 낙인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살에 대한 낙인이 약함・광기・괴로움이라는 고정관념과 불신・부끄러움・두려움 등의 감정적 편견, 회피・경멸・가십(gossip) 등의 행동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레스터와 월터(Lester & Walter, 2006), 박과 동료들(Park et al., 2015), 스코코와 동료들(Scocco et al., 2012)는 낙인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차별을 주려는 태도로 정의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 척도를 개발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 척도를 기반으로, ‘자살 시도자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살 시도자를 일반사람과 똑같이 신뢰할 수 없다’, ‘자살 시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등과 같은 문항을 도출했다.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 및 코리건과 동료들(Corrigan et al., 2017)이 개발한 자살 낙인 척도는 기존 척도의 불명확함을 개선하여,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각 호주와 미국이라는 서구권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낙인은 특정 사회에서 부여된 것으로, 시대와 상황,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Goffman, 1963; Pescosolido et al., 2008). 이와 관련해 양과 동료들(Yang et al., 2007)은 특정 대상을 향한 낙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지만, 낙인을 구성하는 속성 차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미노와 동료들(Domino et al., 2000) 역시 대만과 미국 사람들의 자살 태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쩡과 립슨(Tzeng & Lipson, 2004) 또한 대만 사회의 자살 낙인에는 서양권과 다른 유교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경우, 박종익과 김영주(2011)가 렌버그와 제이콥스(Renberg & Jacobbson, 2003)의 척도를 기반으로, 한국형 자살 태도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일반 성인 남녀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허용성 및 불간섭”차원으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 ‘누군가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등의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두 번째 요인은 “예방 가능성 및 불가해성”차원으로, ‘젊은이들의 자살은 아직 삶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특히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의 자살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등의 5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세 번째 “보편성”요인에는 ‘대부분의 자살시도는 친한 사람과의 갈등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살할 수 있다’등의 3가지 항목이, 마지막 “예측불가능성”요인에는 ‘자살은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자살시도는 충동적인 행동이다’등의 3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이원영과 동료들(2013)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자살 인식 요인이 종교, 정신적/도덕적 병, 허용성/정상성, 노화, 원인, 위험, 충동성, 복수, 위협, 개인적 양상/동기, 소통하지 않음, 비가역성/치명적인 등 12가지로 구성되었다. 한편, 박과 동료들(Park et al., 2015)은 개인적 실패 신호와 차별적 행동을 자살 시도자를 향한 낙인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자살은 정신병리학적 문제보다는,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 행동 혹은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낙인 차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자살 낙인에 대한 국내 척도의 부재로 인해, 기존 연구들(김성완 등, 2008; 조계화, 이현지, 2006; 황세웅, 이선범, 2013)과 보고서들(보건복지부, 20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한국종합자살조사, 2009)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의 속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되는 낙인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탐색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낙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규범과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다양한 속성 차원을 낙인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탐색적 자살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해, 총 4단계 연구 과정을 거쳤다. 현재 한국형 자살 낙인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기존 척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일반인 대상 심층 설문을 함께 수행하여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일반 성인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집된 문항들이 자살 시도자를 향한 낙인의 속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탐색적 추출 과정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문항의 요인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했다.
1. 1단계: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한 항목 정리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반영하는 문항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자살 낙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Batterham et al., 2013; Corrigan et al., 2017; Li et al., 2011; Scocco et al., 2012)에서 설명하는 자살 낙인의 속성을 수집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발표된 자살 태도의 요인 구조 연구(박종익, 김영주, 2014)는 자살 낙인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일반인들의 자살 낙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 스코코와 동료들(Scocco et al., 2012), 코리건과 동료들(Corrigan et al., 2017)의 연구가 유일하다. 우선,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은 일반인 2,700명을 대상으로, 의미차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수행했다. 이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이 총 세 가지의 속성(낙인, 고립/우울, 찬미/정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각 속성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인” 차원은 얕은, 한심한, 부도덕한, 어리석은, 무책임한, 비겁한 등의 31개 항목을 포함한다. “고립/우울” 차원은 외로운, 고립된, 잃어버린, 단절된 등의 10개 항목을, “찬미/정상” 차원은 강한, 숭고한, 헌신적인, 용감한 등의 11개 항목을 포함한다.
코리건과 동료들(Corrigan et al., 2017)은 낙인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자살에 대한 대중들의 낙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 였다. 이들은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에서 3개의 요인을 발견하였다. “약한”이라고 명명된 요인은 겁쟁이, 비이성적, 실패, 이기적 등의 7개 항목이, “광적인” 요인은 약물남용, 정상이 아닌, 얕보는 등의 4개 항목이, “심적 고통” 요인은 도움이 필요한, 우울한, 고통받는 등의 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적 측면인 편견에서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공포/불신”차원에는 두려움, 전염에 대한 공포, 신뢰에 대한 의심이, “분노”차원에는 좌절, 부끄러움, 당혹스러움, 분노가 포함되었다. 행동적 측면인 차별에서는 3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회피”요인에는 거리 유지하기, 피하기, 같이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등의 13개 항목이, “무시”요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불편하게 만들기 등의 4개 항목이, “강압”요인에는 병원에 데려가기, 약을 먹이기, 가두기 등의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한편, 스코코와 동료들(Scocco et al., 2012)은 낙인에 대한 개념을 대상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속성으로 정의하고, 자살 시도자를 향한 일반인의 차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당 항목들은 ‘자살 시도자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살 시도자를 일반사람과 동등하지 못한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살 시도자를 일반사람과 똑같이 신뢰할 수 없다’ 등의 12개 항목이다.
리와 동료들(Li et al., 2011)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예방 가능성”, “개인 통제가능성”, “자살에 대한 낙인”, “자살 시도자를 향한 연민”, “다른 사람들을 통제/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사회적 문제”, “자살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차이”라고 명명된 총 7개 차원이 발견되었다. 이 중 “자살에 대한 낙인” 차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 행동에 대해 분노한다’, ‘자살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등의 10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살 시도자를 향한 연민”차원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연민을 받을 만하다’, ‘때때로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 시도자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등의 7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2. 2단계: 온라인 심층 조사
자살하는 사람을 향한 한국 사회의 낙인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성인 남녀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일대일 심층면담보다 주관식 문항을 이용한 심층 면접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조사는 리서치 회사인 포커스컴퍼니(www.focuscompany.com)에서 대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위 회사에서 보유하는 패널들이다.
조사에 참가한 103명의 응답자들은 남성이 47명(45.6%), 여성이 56명(54.4%)으로, 성별에 대한 차이가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46세(SD=9.70)였으며, 최소 연령은 20세, 최대 연령은 61세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은 47명(45.6%),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참가자들은 56명(54.4%)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대졸이 62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13명(12.6%), 대학원 졸업이 28명(27.2%)로 조사되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응답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한 후에 주관식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설문 시작에 앞서 정답이 없는 설문이며, 객관식 답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간단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주관식 문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문항 당 최소 1분이 지났을 때에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였다. 또한, 주관식 질문에 답변을 적어야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심층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일기 쓰듯이 기술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설문에 임할 수 있도록,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항을 4번에 걸쳐 반복 질문하였고, 답변의 용이성을 위해 ‘자살하는 사람은 OO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3개 이상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용된 4개의 개방형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징이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평소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설문을 통해 총 977개의 답변들이 수집되었다. 연구자들은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raw data)들을 유사한 의미로 묶어나가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한국 문화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속성들이 항목에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통되거나 유사한 의미의 답변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낙인 척도에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였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들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그 결과 총 4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연구자들에 의해 추출된 47개의 항목들이 977개의 답변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대학원생들을 통해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하였다. 전체 답변의 20%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ohen’s Kappa)는 0.87로 나타났다.
온라인 심층 조사를 통해 추출된 항목들과 빈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상위 항목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전체 977건 중 78건(8.0%)의 답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립된’이 53건(5.4%), ‘죄를 짓는’이 51건(5.2%),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한’이 50건(5.1%)으로 나타났다.
표 1
온라인 심층 조사를 통해 추출된 항목의 기술통계 결과
| 순위 | 구분 | 빈도 | % | 순위 | 구분 | 빈도 | % |
|---|---|---|---|---|---|---|---|
|
|
|||||||
| 1 | 의지가 약한 사람 | 78 | 8 | 25 | 통제력이 없는 | 17 | 1.7 |
| 2 | 고립된 | 53 | 5.4 | 26 |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 16 | 1.6 |
| 3 | 죄를 짓는 | 51 | 5.2 | 27 | 사회로부터 박탈된 | 15 | 1.5 |
| 4 |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한 | 50 | 5.1 | 28 | 문제가 있는 사람 | 14 | 1.4 |
| 5 | 무책임한 | 48 | 4.9 | 29 |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 13 | 1.3 |
| 6 | 실패자 | 47 | 4.8 | 30 | 외로운 | 13 | 1.3 |
| 7 | 어리석은 사람 | 42 | 4.3 | 31 | 지나치게 예민한 | 12 | 1.2 |
| 8 |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 38 | 3.9 | 32 | 몰상식한사람 | 11 | 1.1 |
| 9 | 부도덕한 | 29 | 3 | 33 | 쉽게 포기해버리는 | 10 | 1 |
| 10 | 희망이 없고 불행한 | 29 | 3 | 34 | 인생에 대해 비관적인 | 10 | 1 |
| 11 | 안타까움 | 28 | 2.9 | 35 | 불안정한 | 9 | 0.9 |
| 12 | 우울한 | 27 | 2.8 | 36 | 불효 | 9 | 0.9 |
| 13 | 이해할 수 없는 | 27 | 2.8 | 37 | 용기 있는 | 9 | 0.9 |
| 14 |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 26 | 2.7 | 38 | 가치관이 확고하지 못한 | 8 | 0.8 |
| 15 | 불쌍한 | 24 | 2.5 | 39 | 관심을 끌기 위한 | 8 | 0.8 |
| 16 | 이기적인 | 23 | 2.4 | 40 | 폭력적이고 불쾌한 | 8 | 0.8 |
| 17 | 한심스러운 | 20 | 2 | 41 | 아픈 사람 | 6 | 0.6 |
| 18 | 비난받아야하는 | 19 | 1.9 | 42 | 현실이 두렵고 상처를 입은 | 6 | 0.6 |
| 19 |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 19 | 1.9 | 43 | 게으르고 답답한 | 5 | 0.5 |
| 20 | 비정상적인 사람 | 18 | 1.8 | 44 | 체면을 잃어버린 | 5 | 0.5 |
| 21 |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 18 | 1.8 | 45 | 강직한 | 3 | 0.3 |
| 22 |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 17 | 1.7 | 46 | 무정한 | 3 | 0.3 |
| 23 | 독한 사람 | 17 | 1.7 | 47 | 현실에 화가 난 | 2 | 0.2 |
| 24 | 불평이 많은 | 17 | 1.7 | 총 합계 | 977 | 100 | |
3. 3단계: 탐색적 항목 추출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에서 수집된 낙인 항목들과 온라인 심층 조사를 통해 추출된 47개 문항을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이 개발한 낙인 척도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자살 시도자를 향한 다양한 사회적 낙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척도는 총 5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 항목들을 거의 포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의 자살 낙인 척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심층 조사에서 발견된 문항들을 심도 있게 비교하였다. 주관식 문항에서만 발견된 항목, 주관식 문항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의 낙인 척도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예비항목에 추가하였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의미가 비슷한 항목들을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의 척도에서 발견된 ‘차단된’, ‘단절된’ 항목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발견된 ‘고립된’과 유사하다고 보았고, ‘오만한’은 ‘이기적인’과 ‘복수심에 불타는’은 ‘세상에 화가 난’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58개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문헌연구 및 심층조사를 통해 구성된 예비 문항
| 공통 발견 항목 |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의 척도 항목 | ||
|---|---|---|---|
|
|
|||
| 1 | 자살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하다 | 33 | 자살하는 사람은 이성적이다 |
| 2 | 자살하는 사람이 한심스럽다 | 34 | 자살하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다 |
| 3 |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 35 | 자살하는 사람은 숭고하다 |
| 4 | 자살하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 36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적이다 |
| 5 | 자살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몰상식하다 | 37 | 자살하는 사람은 열성적이다 |
| 6 | 자살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 38 | 자살하는 사람은 비참하다 |
| 7 | 자살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 39 | 자살하는 사람은 잔인하다 |
| 8 | 자살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 | 40 | 자살하는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
| 9 | 자살하는 사람은 낙오자이다 | 41 | 자살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사람이다 |
| 10 | 자살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답답하다 | 42 | 자살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
| 11 | 자살하는 사람은 강직하다 | 43 | 자살하는 사람은 골칫거리이다 |
| 12 | 자살하는 사람은 용기(결단력)가 있다 | 44 | 자살하는 사람이 수치스럽다 |
| 13 | 자살하는 사람은 외롭다 | 심층 조사를 통해 발견된 항목 | |
| 14 | 자살하는 사람은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다 | ||
| 15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 45 |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
| 16 | 자살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 46 | 자살하는 사람이 불쌍하다 |
| 17 | 자살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 47 | 자살하는 사람이 안타깝다 |
| 18 | 자살하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 48 | 자살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다 |
| 19 | 자살하는 사람은 폭력적이다 | 49 | 자살하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
| 20 | 자살하는 사람은 불안정하다 | 50 |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한다 |
| 21 | 자살하는 사람은 세상에 화가 나있는 사람이다 | 51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불평이 많다 |
| 22 |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 52 | 자살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
| 23 | 자살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다 | 53 | 자살하는 사람은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다 |
| 24 | 자살하는 사람은 정당화할 수 없다 | 54 | 자살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
| 25 | 자살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이다 | 55 | 자살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 비관적이다 |
| 26 | 자살하는 사람은 소극적이다 | 56 | 자살하는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다 |
| 27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다 | 57 | 자살하는 사람은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
| 28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 58 | 자살하는 사람은 모진 사람이다 |
| 29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 ||
| 30 |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 ||
| 31 | 자살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 ||
| 32 | 자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 ||
추출된 예비문항이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의 속성을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164명의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문항들의 명료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남성이 90명(54.9%), 여성이 74명(45.1%)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45세(SD=10.19)였으며, 최소 연령 21세, 최대 연령 66세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은 76명(46.3%),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참가자들은 88명(53.7%)이었다. 학력은 대졸자가 117명(7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8명(17.1%), 대학원 졸업 15명(9.1%), 고졸 이하가 4명(2.4%)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총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7명(4.3%), 100-200만원이 17명(10.4%), 200-300만원이 24명(14.6%), 300-400만원이 30명(18.3%), 400-500만원이 35명(21.3%), 500만원 이상이 51명(31.3%)이었다. 참가자 중 자살 시도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9명(23.8%)이었으며, 가까운 주변에 자살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44명(26.8%)이었다.
참가자들은 58개의 항목이 자살 시도자를 묘사하는 데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탐색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항 추출을 위해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문항들과 함께 낙인 속성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독립적인 문항들을 제외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추출된 항목들을 직접 읽어보며 문항 간 중복성과 의미의 모호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은 비참하다’, ‘자살하는 사람은 성격적 문제 가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등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속성에 걸쳐 나타나거나, 요인부하 값이 0.4 이하로 낮은 항목들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최종 50개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4. 4단계: 일반인 대상 척도 검증
탐색적 항목 추출 과정을 통해 구성된 50개의 항목이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설명하는 데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살 낙인 척도의 최종 검증은 일반인 5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 회사인 포커스컴퍼니를 통해 진행되었다. 사전 조사에 참여했던 패널들이 재참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참가자들은 남성 251명(49.2%), 여성 259명(50.8%)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세(SD = 12.75)였다. 이밖에 구체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
|||||||
| 성별 | 남자 | 251 | 49.2 | 종교 | 기독교 | 129 | 25.3 |
| 여자 | 259 | 50.8 | 불교 | 59 | 11.6 | ||
| 연령 | 20대 | 127 | 24.9 | 천주교 | 46 | 9.0 | |
| 30대 | 124 | 24.3 | 무교 | 246 | 54.1 | ||
| 40대 | 131 | 25.7 | 가족 월수입 | 100만원 이하 | 21 | 4.1 | |
| 50대 | 128 | 25.1 | 100-200만원 | 50 | 9.8 | ||
| 교육수준 | 고졸 이하 | 9 | 1.8 | 200-300만원 | 87 | 17.1 | |
| 고졸 | 109 | 21.4 | 300-400만원 | 97 | 19.0 | ||
| 대졸 | 352 | 69.0 | 400-500만원 | 94 | 18.4 | ||
| 대학원 | 40 | 7.8 | 500만원 이상 | 161 | 31.6 | ||
|
|
|
||||||
| 주변인 자살자 | 있음 | 99 | 19.4 | 자살 시도자 접촉 | 있음 | 83 | 16.3 |
| 없음 | 411 | 80.6 | 없음 | 427 | 83.7 | ||
Ⅳ. 연구결과
본격적인 탐색적 요인분석(EFA)에 앞서, 전체 항목별 반응 결과를 기술통계 분석하여, 편차가 심한 문항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상위 3개의 문항은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다’(M=4.06, SD=0.84), ‘자살하는 사람은 잔인한 면이 있다’(M=4.04, SD=0.90), ‘자살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부족하다’(M=3.99, SD=0.86)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하위 3개 문항은 ‘자살하는 사람은 숭고하다’(M=1.93, SD=0.94),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무의미한 존재이다’(M=2.16, SD=1.07), ‘자살하는 사람은 이성적이다’(M=2.22, SD=0.94)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3점 전후의 평균 수치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들의 왜도(-0.84 ~ 0.80)와 첨도(-0.94 ~ 0.82) 값은 정규분포조건(-2<왜도<2; -4<첨도<4)에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 척도 차원성 분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살 낙인 척도가 몇 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원성을 검증하였다. 자살 낙인의 요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멕스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최초 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로 낮거나, 0.4-0.5 수준의 요인 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적재되어 있는 항목1)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음 단계의 분석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최종 46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KMO 표본형성 적절성 지표는 0.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x2=16520.12, 자유도=1035, p =0.00). 아이겐 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선정된 요인은 총 7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66.67%를 설명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항목 | 차원 | |||||||
|---|---|---|---|---|---|---|---|---|
|
|
||||||||
| 무능력 | 기질 | 찬미 | 부도덕 | 연민 | 이기 주의 | 배제 | ||
|
|
||||||||
| 1 | 자살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하다 | .793 | .224 | .010 | .163 | .101 | .172 | .150 |
| 2 | 자살하는 사람은 한심스럽다 | .761 | .247 | .052 | .169 | -.034 | .201 | .030 |
| 3 | 자살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 .746 | .223 | .112 | .256 | .013 | .109 | .071 |
| 4 | 자살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된다 | .732 | .263 | .023 | .182 | -.066 | .105 | .101 |
| 5 | 자살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몰상식하다 | .720 | .269 | .140 | .345 | -.133 | .000 | .067 |
| 6 | 자살하는 사람은 수치스럽다 | .688 | .280 | .191 | .376 | -.118 | .014 | .067 |
| 7 | 자살하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 .679 | .077 | -.111 | .099 | .197 | .375 | .177 |
| 8 |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 .640 | .345 | -.045 | .088 | .067 | .329 | .127 |
| 9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의 골칫거리이다 | .603 | .254 | .117 | .403 | -.114 | .055 | .077 |
|
|
||||||||
| 10 |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다 | .351 | .714 | .045 | .217 | .043 | .154 | .139 |
| 11 | 자살하는 사람은 거친 면이 있다 | .279 | .672 | .165 | .306 | -.071 | .102 | .111 |
| 12 | 자살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다 | .329 | .672 | .077 | .203 | .093 | .152 | .220 |
| 13 | 자살하는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 .289 | .607 | .004 | .357 | .055 | .196 | .134 |
| 14 | 자살하는 사람은 소극적이다 | .336 | .600 | .065 | .117 | .037 | .044 | .196 |
| 15 | 자살하는 사람은 예민한 면이 있다 | .222 | .595 | -.032 | -.002 | .246 | .277 | .157 |
| 16 | 자살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 | .443 | .560 | -.048 | .069 | .006 | .170 | .241 |
| 17 | 자살하는 사람은 불안정하다 | .237 | .543 | -.038 | .013 | .377 | .268 | .134 |
|
|
||||||||
| 18 | 자살하는 사람은 열성적이다 | .061 | .067 | .811 | .069 | -.130 | .007 | -.007 |
| 19 | 자살하는 사람은 헌신적이다 | .016 | .071 | .798 | .031 | -.082 | -.076 | .020 |
| 20 | 자살하는 사람은 이성적이다 | .059 | -.019 | .788 | .080 | -.011 | -.089 | .080 |
| 21 | 자살하는 사람은 강직하다 | .033 | .105 | .783 | .104 | -.064 | .040 | -.089 |
| 22 | 자살하는 사람은 숭고하다 | .080 | .086 | .747 | .186 | -.276 | -.093 | .074 |
| 23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적이다 | .000 | -.061 | .742 | -.021 | .078 | -.016 | .099 |
| 24 | 자살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강하다 | .041 | -.049 | .685 | -.028 | .141 | .206 | .106 |
|
|
||||||||
| 25 | 자살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 | .323 | .171 | .111 | .743 | -.014 | .177 | .182 |
| 26 |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 .225 | .063 | -.046 | .727 | .111 | .287 | .104 |
| 27 |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다 | .295 | .054 | .065 | .725 | .051 | .226 | .142 |
| 28 | 자살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 .332 | .286 | .180 | .657 | -.150 | .162 | .161 |
| 29 | 자살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 | .298 | .266 | .145 | .628 | -.072 | .169 | .129 |
| 30 | 자살하는 사람은 잔인한 면이 있다 | .179 | .258 | .153 | .614 | -.040 | .360 | .086 |
|
|
||||||||
| 31 | 자살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 -.014 | .125 | .105 | -.032 | .837 | .067 | .037 |
| 32 | 자살하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 -.071 | .078 | .072 | -.065 | .818 | .053 | -.015 |
| 33 | 자살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 -.039 | -.014 | -.116 | -.022 | .799 | -.011 | .137 |
| 34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 -.035 | .069 | -.107 | .084 | .733 | .109 | .125 |
| 35 | 자살하는 사람은 비극적이다 | .050 | .003 | -.127 | .193 | .732 | .110 | .226 |
| 36 | 자살하는 사람은 안타깝다 | .034 | .034 | -.090 | -.144 | .705 | .133 | -.009 |
|
|
||||||||
| 37 |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 .227 | .225 | -.004 | .312 | .108 | .735 | .146 |
| 38 | 자살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 .245 | .221 | .018 | .353 | .107 | .691 | .169 |
| 39 |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 .191 | .355 | -.010 | .221 | .102 | .640 | .221 |
| 40 | 자살하는 사람은 모진 사람이다 | .179 | .275 | .035 | .287 | .173 | .610 | .064 |
| 41 | 자살하는 사람은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 .211 | .040 | -.109 | .291 | .305 | .572 | .086 |
|
|
||||||||
| 42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다 | .067 | .146 | .093 | .204 | .172 | .091 | .799 |
| 43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 .148 | .178 | .214 | .174 | .024 | -.043 | .754 |
| 44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 .123 | .143 | .005 | .077 | .281 | .156 | .696 |
| 45 | 자살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217 | .327 | .006 | .045 | .059 | .329 | .639 |
| 46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 .168 | .382 | .005 | .223 | .077 | .344 | .584 |
첫 번째 요인은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약 13.43%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항목들로는 ‘자살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하다’, ‘자살하는 사람은 한심스럽다’ 등이 있다. 첫 번째 요인에 속한 항목들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 본 연구는 이를 “무능력 낙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분산의 약 10.05%를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거친 면이 있다’ 등의 문항들이 속해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기질 낙인”으로 명명하였다. 총 7개의 항목들이 묶인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9.74%를 차지하였다. 세부 항목들은 ‘자살하는 사람은 열성적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헌신적이다’ 등으로, 본 연구는 이를 “찬미 낙인”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총 6개 항목으로 전체 분산의 약 9.62%를 설명하였다. 해당 항목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도덕성 낙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총 6개 항목으로, 여기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아픔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9.46%를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연민 낙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분산의 약 7.55%를 설명한 여섯 번째 요인은 총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본 연구는 해당 요인을 “이기주의 낙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인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6.81%를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사회적 배제 낙인”이라고 명명하였다.
2. 항목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7개 차원에 해당하는 각 하위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항목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탐색적 척도의 경우,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70 이상일 때 각 차원의 항목간 내적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데(Nunally, 1978), 분석결과 모든 차원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46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947이었으며, 무능력 낙인은 0.933, 기질 낙인은 0.899, 찬미 낙인은 0.886, 부도덕 낙인은 0.878, 연민 낙인은 0.903, 이기주의 낙인은 0.880, 사회적 배제 낙인은 0.860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7개 차원으로 구성된 자살 낙인 척도의 각 차원은 매우 높은 내적 일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척도 타당도 분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살 낙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척도와의 수렴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척도의 구성 타당도는 해당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척도와의 비교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코코와 동료들(Scocco et al., 2012)이 개발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낙인 척도(Stigma of Suicide Attempt; STOSA),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이 개발한 자살 낙인 척도(Stigma of Suicide Scale; SOSS), 리와 동료들(Li et al., 2011)이 개발한 자살에 대한 공중 태도 척도(Scale of Public Attitudes about Suicide; SPAS)를 활용하여, 새로운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낙인 척도(STOSA)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29로 확인되었다. 자살 낙인 척도(SOSS)는 총 16개 문항(Cronbach’s α=0.853)으로 이루어진 축약형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다시 낙인 차원(Stigma: 8개 문항, Cronbach’s α=0.869), 고립 차원(Isolation: 4개 문항, Cronbach’s α=0.882), 찬미 차원(Glorification, 4개 문항, Cronbach’s α=0.854)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10개 문항에 대한 자살에 대한 공중 태도 척도(SPAS)에 대한 신뢰도는 0.868이었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살 낙인 척도와 기존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낙인 척도(STOSA)는 연민 낙인(r=.01, p >.05)을 제외한 나머지 무능력 낙인(r=.66, p <.01), 기질 낙인(r=.67, p <.01), 찬미 낙인(r=.20, p <.01), 부도덕성 낙인(r=.64, p <.01), 이기주의 낙인(r=.58, p <.01), 사회적 배제 낙인(r=.55, p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살 낙인 척도(SOSS)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 낙인(Stigma)차원과는 7가지 차원이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살 낙인 척도(SOSS)의 고립(Isolation) 유형의 경우에는 찬미 낙인(r=-.06, p >.05)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차원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살 낙인 척도(SOSS)의 마지막 유형인 찬미(Glorification)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척도의 부도덕성 낙인(r=-.21, p <.01)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6가지 유형과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 공중 태도 척도(SPAS)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5
변인 간 상관관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1. 무능력 낙인 | 1 | |||||||||||
| 2. 기질 낙인 | .72** | 1 | ||||||||||
| 3. 찬미 낙인 | .15** | .11* | 1 | |||||||||
| 4. 부도덕성 낙인 | .03 | .20** | -.10** | 1 | ||||||||
| 5. 연민 낙인 | .67** | .59** | .22** | .02 | 1 | |||||||
| 6. 이기주의 낙인 | .58** | .63** | .02 | .31** | .66** | 1 | ||||||
| 7. 사회적 배제 낙인 | .45** | .60** | .15** | .28** | .49** | .53** | 1 | |||||
| 8. STOSA | .66** | .67** | .20** | .01 | .64** | .58** | .55** | 1 | ||||
| 9. STIGMA (SOSS) | .66** | .69** | .18** | .09* | .72** | .71** | .58** | .74** | 1 | |||
| 10. ISOLATION (SOSS) | .17** | .32** | -.06 | .51** | .20** | .43** | .54** | .22** | .40** | 1 | ||
| 11. GLORIFICATION (SOSS) | .23** | .16** | .72** | -.21** .32** | .11* | .18** | .28** | .27** | -.15** | 1 | ||
| 12. SPAS | .72** | .73** | .17** | .10* | .74** | .72** | .57** | .74** | .82** | .34** | .28** | 1 |
주: STOSA(Stigma of Suicide Attempt): 자살 시도자에 대한 낙인 척도 by Scocco et al. (2012)
SOSS(Stigma of Suicide Scale): 자살 낙인 척도 by Batterham et al. (2013)
표 6
자살 낙인 최종 척도의 차원별 기술통계와 신뢰도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신뢰도 |
|---|---|---|---|---|---|
|
|
|||||
| 무능력 낙인 | 2.71 | .90 | .17 | -.40 | .933 |
| 자살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모하다 | 2.93 | 1.19 | -.02 | -.95 | |
| 자살하는 사람은 한심스럽다 | 2.76 | 1.15 | .22 | -.65 | |
| 자살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 2.55 | 1.13 | .41 | -.54 | |
| 자살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된다 | 2.65 | 1.01 | .31 | -.42 | |
| 자살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몰상식하다 | 2.29 | 1.10 | .63 | -.21 | |
| 자살하는 사람은 수치스럽다 | 2.37 | 1.07 | .49 | -.37 | |
| 자살하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 3.36 | 1.16 | -.34 | -.69 | |
|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 3.02 | 1.13 | -.13 | -.79 | |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의 골칫거리이다 | 2.49 | 1.09 | .35 | -.49 | |
|
|
|||||
| 기질 낙인 | 2.99 | .83 | -.28 | -.16 | .899 |
|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다 | 2.93 | 1.12 | -.06 | -.78 | |
| 자살하는 사람은 거친 면이 있다 | 2.62 | .99 | .16 | -.24 | |
| 자살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다 | 2.91 | 1.09 | -.07 | -.61 | |
| 자살하는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 2.85 | 1.07 | -.01 | -.60 | |
| 자살하는 사람은 소극적이다 | 2.78 | 1.08 | .05 | -.73 | |
| 자살하는 사람은 예민한 면이 있다 | 3.36 | 1.03 | -.52 | -.18 | |
| 자살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 | 2.95 | 1.19 | -.07 | -.94 | |
| 자살하는 사람은 불안정하다 | 3.58 | 1.08 | -.63 | -.23 | |
|
|
|||||
| 찬미 낙인 | 2.30 | .74 | .36 | .06 | .886 |
| 자살하는 사람은 열성적이다 | 2.24 | .91 | .43 | -.06 | |
| 자살하는 사람은 헌신적이다 | 2.22 | .94 | .43 | -.01 | |
| 자살하는 사람은 이성적이다 | 2.22 | .94 | .44 | -.21 | |
| 자살하는 사람은 강직하다 | 2.34 | .88 | .36 | .05 | |
| 자살하는 사람은 숭고하다 | 1.93 | .94 | .80 | .11 | |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적이다 | 2.53 | 1.02 | .16 | -.54 | |
| 자살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강하다 | 2.60 | 1.07 | .33 | -.50 | |
|
|
|||||
| 부도덕성 낙인 | 3.93 | .70 | -.64 | .46 | .878 |
| 자살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 | 3.78 | .94 | -.76 | .56 | |
|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 | 3.78 | .91 | -.63 | .34 | |
| 자살하는 사람은 남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다 | 4.06 | .84 | -.84 | .82 | |
| 자살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 3.99 | .86 | -.77 | .68 | |
| 자살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 | 3.92 | .88 | -.64 | .33 | |
| 자살하는 사람은 잔인한 면이 있다 | 4.04 | .90 | -.84 | .58 | |
|
|
|||||
| 연민 낙인 | 2.66 | 0.86 | 0.21 | -0.15 | .903 |
| 자살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 2.6 | 1.02 | 0.38 | -0.2 | |
| 자살하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 2.96 | 1.05 | 0.04 | -0.46 | |
| 자살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 2.76 | 1.09 | 0.2 | -0.56 | |
| 자살하는 사람은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 2.44 | 1.03 | 0.52 | -0.07 | |
| 자살하는 사람은 비극적이다 | 2.59 | 0.98 | 0.26 | -0.22 | |
| 자살하는 사람은 안타깝다 | 2.61 | 1.09 | 0.25 | -0.58 | |
|
|
|||||
| 이기주의 낙인 | 3.23 | .90 | -.25 | -.31 | .880 |
|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 3.19 | 1.08 | -.22 | -.58 | |
| 자살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 3.09 | 1.10 | -.10 | -.62 | |
|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 3.19 | 1.06 | -.16 | .51 | |
| 자살하는 사람은 모진 사람이다 | 3.12 | 1.11 | -.21 | -.70 | |
| 자살하는 사람은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 3.57 | 1.10 | -.59 | -.24 | |
|
|
|||||
| 사회적 배제 낙인 | 3.14 | .77 | -.20 | -.07 | .860 |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다 | 3.15 | 1.00 | -.15 | -.40 | |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 2.83 | .97 | .16 | -.28 | |
| 자살하는 사람은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 3.43 | .92 | -.37 | -.14 | |
| 자살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3.18 | .97 | -.23 | -.21 | |
|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 3.13 | .97 | -.16 | -.36 | |
Ⅴ. 결론
한국 사회에는 30분에 1명씩 누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통계청, 2016).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고려할 때, 자살 고위험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살은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취약한 문제임에도, ‘나와 상관없는 일’, ‘특정 사람들의 문제’라는 사회적 시각이 강하다(보건복지부, 20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관 심을 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WHO, 2014), 실제 자살로 사망한 한국인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15). 본 연구는 높은 자살률에 비해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활용의 원인 중 하나로 자살 시도자를 향한 낙인을 주목하고,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탐색하여 자살 낙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살 시도자를 향한 일반인들의 낙인은 총 4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7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는차원은 “부도덕성 낙인”이었다. 여기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죄를 짓는 사람이다’, ‘도덕성이 부족하다’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자리잡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부도덕성 낙인 차원은 기존 자살 인식 조사(보건복지부, 20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던 부분이다. 이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살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보다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난 차원은 “이기주의 낙인”이었다. 특히, 해당 차원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모진 사람이다’ 등의 유교적인 문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 및 코리건(Corrigan et al., 2017)이 개발한 자살 낙인 척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분석한 조긍호(2000)에 따르면,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는 동기가 강하다. 이러한 자기 억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개인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 때문이다(조긍호, 2003, 2007). 특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이기적 행동은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결점으로 이해된다(조긍호, 2000). 즉,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자살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탈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향한 이기주의 낙인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문화권인 대만 사회의 자살 낙인을 질적으로 조사한 쩡과 립슨(Tzeng & Lipson, 2004)의 연구에서 ‘불효’라는 낙인이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즉,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배제 낙인”, “기질 낙인”, “무능력 낙인”이 발견되었다. 먼저, “사회적 배제 낙인” 차원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주류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관련하여, “기질 낙인” 차원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거나 거칠며, 예민하거나 의지가 약한 특성을 보인다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무능력 낙인” 차원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한심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이며, 사회의 골칫거리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었다. 특정 사회의 가치에 벗어나는 속성에 근거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는 낙인의 개념(Goffman, 1963)에 빗대어 볼 때, “기질 낙인”, “무능력 낙인”과 “사회적 배제 낙인”의 높은 관련성이 예상된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자살 인식을 들여다본 이하나와 안순태(2015)는 자살 시도자들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자살 태도 조사(보건복지부, 2014)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자살 시도자를 향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차별적 태도는 자살 치료와 예방전략을 개발하는데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상에서 발견된 자살 낙인은 모두 자살의 원인이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낙인은 자살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Chan et al., 2014; Rudd et al., 2013). 다행히, 자살의 원인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낙인은 자살 리터러시(suicide literacy)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살 리터러시는 자살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차원과 구별되는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지식으로, 자살 낙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Batterham et al., 2013; Chan et al., 2014).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은 자살 낙인이 자살 리터러시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낙인화된 질병의 이해수준(literacy)이 향상되면, 이를 둘러싼 낙인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예방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이 개인을 성장시킨다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자살 낙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안순태와 이하나(2017)의 연구에서, 자살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살의 원인과 신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자살 예방 전략에는 자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낙인 감소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5가지 차원은 대체로 자살 시도자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들을 보여준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독특한 요인은 “연민 낙인”이다. 자살하는 사람을 사회의 부적절한 존재로 비난하는 한편,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연민 낙인”은 “부도덕성 낙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다른 차원들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빈곤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디어의 보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배준성, 허태균, 2010; 유현재, 송지은, 2012). 특히, 해당 차원은 기존 서구권 국가에서 개발된 낙인 척도들(Batterham et al., 2013; Corrigan et al., 2017)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인 중국에서 개발된 연구(Li et al., 2011)에선 발견된 부분이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살 시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양면적(ambivalent)임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자살 시도자를 향한 이중적 낙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낙인이 자살 치료나 예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 검증이 요청된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마지막 차원은 “찬미 낙인”이다. 해당 차원은 자살하는 사람이 강직하고, 숭고하며, 헌신적이라는 긍정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살보다는 정치인, 예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을 향한 인식으로 여겨진다. 역사적 기록이나 문학작품, 드라마나 뉴스 속에는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거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혹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묘사된다(이창언, 2009; 제해종, 2015; Winslow, 1840). 본 연구에서 발견된 ‘찬미 낙인’은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에 의해 개발된 척도는 물론, 이전 자살 태도 척도(Diekstra & Kerkhof, 1988; Domino et al., 1982)에도 포함되어 있는 차원이다. 이러한 낙인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던 자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정신병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Chan et al., 2014; WHO, 2014), 후속 연구에서는 찬미 낙인이 형성된 원인과 이로 인한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하는 대상에 따라 사회적 낙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대상별 자살 낙인 척도 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탐색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첫 연구로서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자살 낙인에 관심을 갖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배터햄과 동료들(Batterham et al., 2013)이 개발한 척도에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을 추가하고, 낙인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자살 낙인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서구권에서 개발된 척도들(Batterham et al., 2013; Corrigan et al., 2017)과의 차이점은 낙인이 특정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척도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작업이 자칫 잘못된 낙인 파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이를 둘러싼 낙인 해소가 우선되어야하는 만큼(WHO, 2014),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한국 사회의 낙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낙인 감소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의 취약성과 자살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WHO, 2014),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자살하는 사람을 부도덕적이고, 무능력하고, 이기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즉, 본 척도는 자살을 개인적 자질과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잘못된 관점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자살 낙인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척도는 ‘만약 당신이 스스로 포기 한다면 모두의 희망도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와 같은 국내 자살 예방 슬로건이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의 무능력함과 이기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슬로건이 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요소가 무엇일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척도는 자살 낙인을 구성하는 속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자살 주체에 따른 낙인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잇을 것이다.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등 주체에 따른 자살 낙인 차원을 비교하고, 대상별 맞춤 전략을 계획함에 있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연령, 나이, 교육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자살 낙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이나 낙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목표 공중 설정과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본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제한점을 가진다. 리서치 회사에서 보유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만큼, 앞으로 본 척도의 대표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파악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작업은 본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항목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통계 분석 (비직각회전방식, oblique)도 요청된다. 추가로,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살 낙인(social stigma)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들이 느끼는 자기 낙인(self stigma)에 대한 조사와 척도 개발도 앞으로 필요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Corrigan, 2004),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향후 자살에 대한 자기 낙인 척도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0분에 1명이 목숨을 끊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불효를 저지르는 이기적이고 모진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낙인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서구문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기주의 낙인은 규범적 차원에서 자살 시도자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자살예방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보인다.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외면당하거나, 도움 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 낙인의 7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2015).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 http://www.psyauto.or.kr/main.asp
. (2014). 2013 자살 실태조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jsessionid=51F277F8468F157EF4CC6DA20B071546.node02?research_id=1351000-201300187에서 2017.2.25. 인출
.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http//www.kossda.or.kr/w02_01e.asp?gs_DControlNo=9853&CurrPos=0&gs_DType=aa에서 2017.2.25. 인출
, , & (2013). The Stigma of Suicide Scale. Crisis, 34, 13-21. [PubMed]
, , & (2013). Correlates of suicide stigma and suicide literacy in the commun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3(4), 406-417. [PubMed]
, , , , & (2005). Suicidal behavior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Revista Brasileira de Psiquiatria, 27(1), 45-53. [PubMed]
, , & (2014). Predictors of help-seeking for suicidal ideation in the community: Risks and opportunities for public suicide prevention campaigns. Psychiatry Research, 219(3), 525-530. [PubMed]
, , , & (2014). Suicide literacy, suicide stigma and help-seeking intentions in Australian medical students. Australasian Psychiatry, 22(2), 132-139. [PubMed]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PubMed]
, , , & (2017). Making sense of the public stigma of suicide. Crisis. [PubMed]
, & (1999). Lessons from social psychology on discrediting psychiatric stigma. American Psychologist, 54(9), 765-776. [PubMed]
(2005). Cross-cultural attitudes towards suicide: the SOQ and a personal odysse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9(2), 107-122. [PubMed]
, , , & (1982). Attitudes toward suicide: A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257-262. [PubMed]
, & (2009). Public awareness campaigns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 review. Psychiatric Services, 60(9), 1203-1213. [PubMed]
, , , & (2003). Suicide prevention: a study of patients’ view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3), 261-265. [PubMed]
, & (2000). The construction of the SEDAS: a new suicide-attitude questionnair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2(2), 139-146. [PubMed]
, , , & (2011). A systematic review of scales that measure attitudes toward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7(4), 338-361. [PubMed]
, & (2006). The stigma for attempting suicide and the loss to suicide prevention efforts. Crisis: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7(3), 147. [PubMed]
, & (2006). Stigma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 The Lancet, 367(9509), 528-529. [PubMed]
, , , , , , et al. (2005).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 systematic review. JAMA, 294(16), 2064-2074. [PubMed]
, , , & (2015). Factors affecting stigma toward suicide and depression: A Korean nationwid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8), 811-817. [PubMed]
, & (2003).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attitudes towards suicide (ATTS) and its application in a Swedish popul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1), 52-64. [PubMed]
, , & (2013). Stigma and suicide warning sign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3), 313-318. [PubMed]
, , , & (2012). Stigma of Suicide Attempt (STOSA) scale and Stigma of Suicide and Suicide Survivor (STOSASS) scale: two new assessment tools. Psychiatry Research, 200(2), 872-878. [PubMed]
, , , & (2016). Stakeholder perspectives on the stigma of suicide attempt survivors. Crisis, 38(2), 73-81. [PubMed]
, & (2001). The stigma of suicid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2), 178. [PubMed]
, & (2004). The cultural context of suicide stigma in Taiw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3), 345-358. [PubMed]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Available: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31056/1/9789241564779_eng.pdf에서 2017.2.25. 인출
, , , , , & (2007). Culture and stigma: adding moral experience to stigma theory. Social science & medicine, 64(7), 1524-153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4-27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6-1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6-23

- 3180Download
- 486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