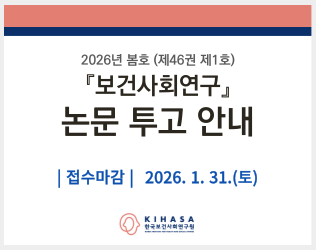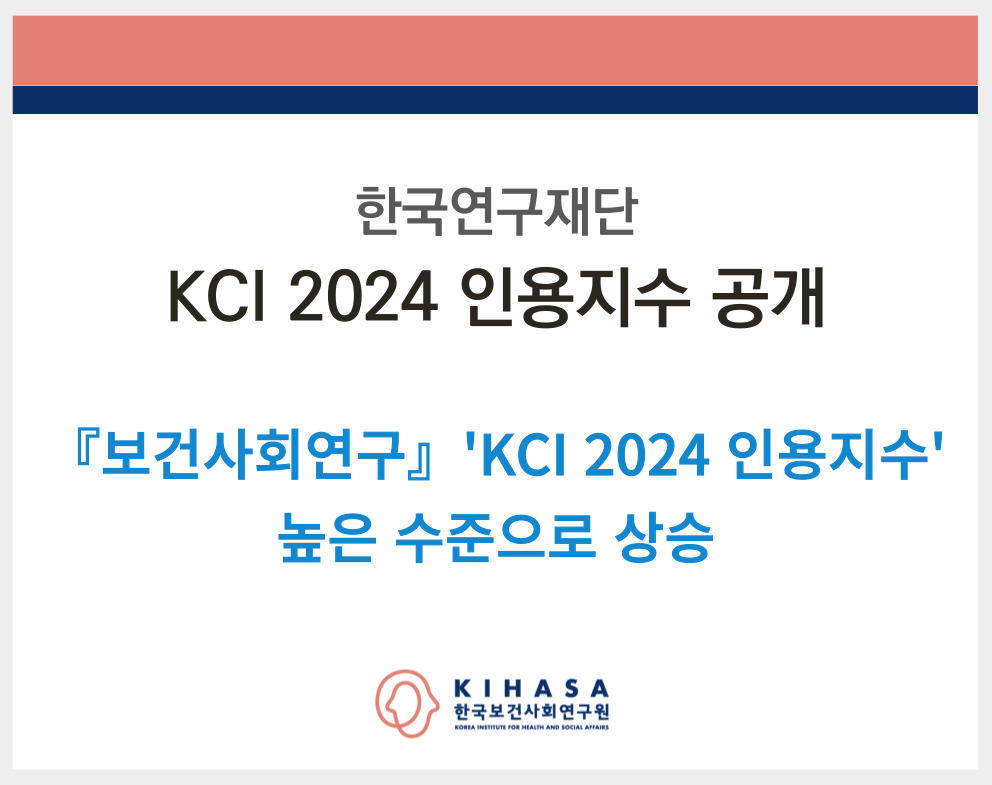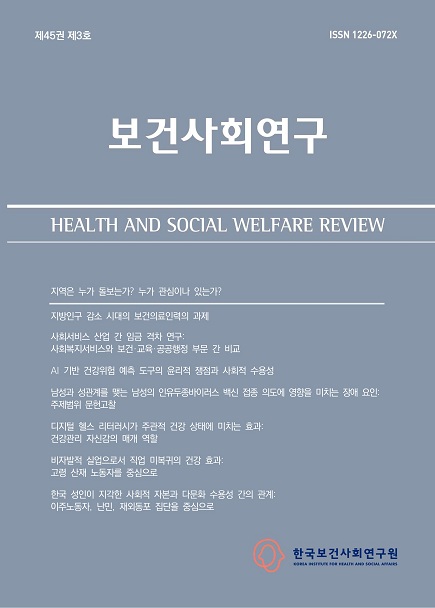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ISSN : 1226-072X(Print), 2671-4531(Online)
- 창간일 : 1981.07.31
- 최신호 : 제45권 제4호
Latest Articles
제45권 제4호Vol.45, No.4
이 권호에 30개 논문이 있습니다.
Joo, Eunsun(Kyongg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1-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1
Lee, Jonghyung(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Lee, Junvae(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23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offlin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their structural dynamics. Using 2018-2022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 applied a multi-group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autoregressive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in both genders, with greater stability among females. Offline delinquency exhibited higher autoregression in females, while cyber delinquency increased sharply in recent waves, especially among female students.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gender-specific patterns, such as cyber delinquency strongly influencing offline delinquency in mal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gender-responsive interventions and multi-layered strategies that address both real-world and digital forms of adolescent delinquen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 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8~2022 (중1-고2)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 기반한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자기회귀 효과를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높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나타냈다. 현실비행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자기회귀 계수가 더 높았으며, 사이버비행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시점에서 자기회귀 계수가 급증하였다. 교차지연 분석에서는 남학생의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성별에 따른 인과구조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특화된 중재 및 예방 전략의 필요성과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oo, Jahyeon(Korea Labor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24-4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4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impact of a pilot project aimed at improving the shift-work system for nurses on their turnover rates in Korea.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for the period 2019-2023, I apply a two-way fixed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that leverages variations in the timing of the pilot program’s adoption across hospita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rse turnover rat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0.8 percentage points and the share of nurses tho stayed more than three years increased by 2.6 percentage points in participating hospitals,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ones. The effects were especially pronounced among nurses in their 20s and 30s and among those with less than six years of work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uctured shift scheduling and support from dedicated training nurses can improve retention by enhancing working conditions.
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자료를 활용해 인과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병원별 시범사업 도입 여부와 시점 차이를 활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비참여 병원 대비 약 0.8%p 감소하고, 3년 이상 근속률은 약 2.6%p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20·30대 및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행정자료를 활용해 교대제 개선 정책의 실질적 고용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가 간호 인력 유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Lim, Min Kyoung(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5-6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5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end-of-life medical costs based on the decision-maker, highlighting that, despite the purpose of ensuring patient autonomy, decision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often made by proxies, such as family members, rather than by patients themselves.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dical costs, and healthcare utilization patterns depending on who mad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Specifically, the patient-led decision-making group, particularly those who completed advance directiv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high-income individuals, lower end-of-life medical costs, and higher hospice care utilization rates.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by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patient autonomy and eliminating potential sources of discrimination.
초록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의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특성이나 치료 강도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유형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생애말기 의료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가족 결정군보다 환자 결정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고, 환자 결정군에서 가족 결정군보다 생애말기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높았다. 이에 생애말기 치료결정에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Chon, Yongho(Incheon National University) ; Lee, Mijin(Konkuk University) ; Nam, Hyunjoo(Gachon University) ; Kwon, Hyun-Jung(Youngs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65-9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65
Abstract
The United Kingdom (in particular England) stands as a pioneering nation in the marketisation and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exerting considerable influence on welfare states around the world. Recently, South Korea has witnessed an intense financialisation of its long-term care sector, marked by the emergence of financial capital—particularly private equity funds—as principal providers in the marke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cies driving the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in the UK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specific focus on care homes, and to analyse the outcomes that have resul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e equity groups managing large-scale care chains have become the dominant providers within the adult care market in the UK. However, the sector’s increasing instability is exacerbated by structural issues such as high leverage ratios, deliberate tax minimisation strategies geared towards profit maximisation, complex governance frameworks, stratification of care, and diminished service quality stemming from workforce underutilisation. The UK’s advanced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faceted and proactive approach in responding to the financialisation of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초록
영국은 돌봄 분야에서 시장화와 금융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 나라로 많은 복지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자본이 성인 돌봄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자로 등장하면서 금융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대규모 체인을 보유한 사모펀드 그룹이 성인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주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세금신고 감축, 복잡한 지배구조, 돌봄의 계층화, 인력의 저사용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각종 이슈가 구조화되면서 성인 돌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앞선 경험은 한국 장기요양의 금융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ang, Hee-Ju(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Kang, Hyun Ah(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hn, Seon-Kyeong(Ewha Womans University) ; Yang, Yu-jin(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Min-Ji(Sookmyung Women's University) ; Chung, Ick-Joong(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91-115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91
Abstract
This study qualitatively analyzed YouTube channels operated by socially withdrawn and isolated youth who voluntarily disclosed their lives on the platform. It explored in depth the background of their withdrawal, the patterns of isolated living, the motivations for digital engagement, and the changes experienced through these activities.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155 videos from five channels were examined, yielding 13 subcategories and four overarching categories. The core theme identified was “The Healing Journey of Socially Withdrawn Youth: Reconnecting in the Digital Worl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reported repeated traumatic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including family dissolution, school bullying, and emotional neglect—as well as adverse events in young adulthood. In the absence of emotional support systems, these experiences often led participants to choose social withdrawal. Second, YouTube functioned not merely as a source of entertainment but as a psychologically safe space, where self-disclosure and digital storytelling served as a catalyst for trauma re-interpretation and personal growth. Third, interactions with viewers and subscribers fostered new forms of social support, and for some participants, these exchanges opened opportunities to experiment with social particip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d both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social work.
초록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은둔·고립 청년들의 채널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은둔의 배경과 고립된 삶의 양상, 디지털 활동의 동기와 이를 통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5개 채널의 155개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귀납적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3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중심 주제로는 ‘은둔·고립 청년의 상처 회복 여정: 디지털 세계에서 다시 연결되다’가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반복된 외상을 경험하며 정서적 지지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은둔·고립을 선택하였다. 둘째, 유튜브는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지대로 기능하였고, 자기노출과 자기서사는 외상 재해석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구독자와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며, 일부 참여자에게는 사회참여와 적응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의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o, Hyeon-Jong(Sungkyunkwan University) ; Kang, Jun-Hyeok(Eulj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116-14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116
Abstract
Drawing on the lived experiences of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how state-induced concealment generates moral injury and institutional exclusion, and proposes experience-centered policy interventions to redress these structural failures.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individuals who had performed special miss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both within-case and cross-case analysis method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hared themes of their experiences. The findings reveal that participants commonly experienced ongoing stress related to confidentiality obligation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and social isolation after discharge. A key issue raised was the insufficiency of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s and support mechanisms to enable meaningful recovery and reintegrat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unique status of Special Operations Personnel as “concealed victims” and the enduring nature of their trauma.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toward experience-based policies for veterans. Recommendation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recovery-oriented counseling systems,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support for post-training aftereffects, and the design of institutional frameworks grounded i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ffected individuals.
초록
본 연구는 국가에 의한 ‘은폐’가 개인의 ‘상처’와 ‘제도적 배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특수임무수행자 경험을 통해 분석하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총 6명의 특수임무수행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병행하여 당사자 경험의 구조적 특성과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기밀 유지 스트레스,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립감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제도와 지원이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의 ‘은폐된 희생자’로서의 특수성과 트라우마의 연속성을 규명하였으며, 경험 기반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회복중심 상담체계 도입, 훈련 후유증 관리체계 구축,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제도 설계 등 실천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Shon, En-Jung(Duksung Wome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141-16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14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deficit in self-efficacy on health beliefs and influenza vaccination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Ohio, U.S. A total of 394 students were included (Whites: 36.5%, Black: 18%, Hispanic: 19.5%, Asian: 25.9%). The PROCESS macro was employed to assess the mediating roles of health belief constructs—perceived barriers, benefits, susceptibility, and severity—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influenza vaccination. Findings revealed that a self-efficacy deficit significantly increased perceived barriers (B=0.72, p<.01), while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maining health belief constructs.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perceived barri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influenza vaccination non-adherence (Effect=-0.18, 95%CI [BootLLCI:-0.34, BootULCI:-0.05]). 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deficit and perceived benefits was not significant, a partial mediation effect was observed (Effect =-0.05, 95%CI [BootLLCI:-0.12, BootULCI:-0.004]).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strategies designed to enhance self-efficacy are essential for improving influenza vaccination uptake among young adults. Professionals in healthcare, social work, and community health settings may promote vaccination behavior by providing tailored counseling, group-based education, and peer-support programs.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and promoting influenza vaccination behavior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지역 대학 재학생의 자기효능감 결여가 건강 신념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고, 연구에는 총 394명이 참여하였다(백인 36.5%, 흑인 18%, 히스패닉 19.5%, 아시안 25.9%). 건강 신념의 주요 요인으로 인지된 장애, 인지된 이득,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심각성이 포함되었으며, 건강 신념이 자기효능감 결여와 백신접종 행위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결여가 심각할수록 인지된 장애를 강화했지만(B=0.72, p<.01),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이득/민감성/심각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장애 요인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백신접종 행위를 감소시켰다(Effect=-0.18, 95%CI [BootLLCI: -0.34, BootULCI: -0.05]). 또한, 자기효능감 결여가 인지된 이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효능감 결여는 인지된 이득을 매개로 백신접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Effect=-0.05, 95% CI [-0.12,-0.004]). 따라서, 청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 사회복지, 지역사회 보건 분야 전문가는, 맞춤형 상담, 집단교육, 동료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ae, Hojoong(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ang, Ins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168-189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168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on the timing of first childbirth among newlyweds. Employing data from the 4th to 26th Korean Labor Panel Survey (KLIPS), we conduct survival analysi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ith the period from marriage to first childbirth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particular, we include dual-income status as a moderator variable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and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The results indicate that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itself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dual-income statu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is suggests that in dual-income households, the mere expectation that the husbands can take parental leave can significantly influence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a factor that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its structural effect on childbirth behavior. This stands in contrast to existing literature, which has mainly focused on women-centered care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혼인~출산 간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맞벌이 여부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육아휴직 가능성과 출산 이행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단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여부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자체로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여성 중심의 돌봄 제도에 초점을 맞춰온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그 출산행위에 대한 구조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m, Donghyeok(Cheongju University) ; Jang, Eunha(Cheongju University) ; Hong, Seokho(Cheongju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190-208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190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whether 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function of resilience as a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 in the process by which satisfaction derived from work contributes to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study used data from 838 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n from the 6th wave (2023) of the Disability Lif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job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increases in both resilie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that resilience had a positiv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Resilience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both external (hygiene) and internal (motivation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thereby strengthening resilience, which in turn leads to improved life satisfaction, creating a virtuous cyc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that focus on improving job quality and supporting psychological resources beyond simply expanding the quantity of jobs provided for the disabled.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만족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갖는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에 주목하였다. 연구는 202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대상자 중 일자리가 있는 근로장애인 8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 회복탄력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적인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직무만족도의 외적 요인(위생요인)과 내적 요인(동기요인)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로 작용함으로써 직무만족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정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일자리 직무의 질적 개선과 심리적 자원 지원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의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Jeong, Hye-ji(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 Im, Sol(Kwangwoo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209-23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09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way adolescent gambling issues have been problematicized within South Korean policy and social discourse. We applied Bacchi’s WPR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ducted a discourse analysis on policy documents, media reports, and academic literature from 2007 to 2025. The entire period was segmented into the Pre-problematicization Period (2007–2014), the Transition Period (2015–2019), and the Problematicization Period (2020–2025).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 gambling was initially treated as a secondary issue of adult gambling, but it transitioned into an independent agenda following national surveys and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s. Seco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ominant language shifted toward terms like 'illegal,' 'criminal,' and 'control,' intensifying a discourse that framed adolescents primarily as objects of protection and regulation. Third, this reinforced discourse had the effect of stigmatizing adolescents and excluding their agenc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re-problematicization strategy that combines a Public Health Model—which employs a balanced approach encompassing prevention, regulation, and support—with the assurance of adolescents' rights to health and participation. This re-problematicization approach can serve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balanced system of prevention, treatment, and support that ensur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and minimizes stigmatization in the future.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 사회 담론 속에서 문제화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Bacchi(2009)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정책 문서, 언론 보도,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문제화기(2007~2014), 문제화 전환기(2015~2019), 문제화기(2020~2025)로 전체 시기를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성인 도박의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을 거치며 독립적인 의제로 전환되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법’, ‘범죄’, ‘통제’의 언어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담론이 강화됐다. 셋째, 이러한 담론은 청소년을 낙인화하고 주체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규제·지원의 균형적 접근을 갖춘 공중보건모델과 청소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기반한 대안적 재문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재문제화 방식은 향후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낙인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예방·치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hoi, Minjae(McGill University) ; Lee, Yo Han(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235-258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3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suicide rates in Seoul from 2000 to 2023. We used cause-of-death data to identify suicide deaths in Seoul. Suicide rates were calculated by sex, age, and method (hanging, poisoning, gas poisoning, jumping, drowning, and others). Joinpoin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ime points where suicide trends changed and to estimate the annual percent change (APC) and corresponding 95% confidence intervals (CIs). Area-specific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ASMR) and ratios (SMR) of suicide were calculated for 25 districts and visualized for each period (2000-2005, 2006-2011, 2012-2017, and 2018-2023). Suicide rates in Seoul increased around 2010 but began to decrease thereafter. However, in recent years, female suicide rates have increased, particularly among adolescents (APC: 11.2%, 95% CI: 4.0-35.0) and young adults (APC: 4.1%, 95% CI: 0.6-16.1) since 2015. Hanging was the most common method followed by poisoning, gas poisoning, and jumping, with patterns changing over time. Suicide rates varied across districts, with some showing a higher increase than the average (SMR>1). The recent increases in suicides among young women highlight the need for urgent action. A coordinated public health approach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자살사망률의 시계열적 추이와 공간적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살사망자를 추출하여, 성별, 연령별, 수단별(목맴, 중독, 가스중독, 추락, 익사, 기타)로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며, 추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인포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변화 시점과 연간 변화율 및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및 사망비를 산출하여 자살률의 지역적 변이를 기간별(2000–2005, 2006–2011, 2012–2017, 2018–2023)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자살사망률은 지난 20여 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성의 자살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10–18세 청소년(연간 증가율: 11.2%, 95% 신뢰구간:4.0-35.0)과 19–39세(연간 증가율: 4.1%, 95% 신뢰구간: 0.6-16.1) 청년층에서 증가가 관찰되었다. 자살수단은 목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중독, 가스중독, 추락으로 인한 자살도 많았으며, 시기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자살률은 대체로 서울시 자살사망률의 추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자살사망비>1). 최근 여성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살률 변화의 기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Oh, Jongmin(Ewha Womans University) ; Choi, So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hin, Ji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259-28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59
Abstract
Components of a “good death” may include not only hospice service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also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one of the fastest rates of population aging, with the number of annual deaths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nd related policie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uth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examine thei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and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to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related systems and servi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pen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with family were limited. Although awareness of end-of-life care systems was relatively high, willingness to use these services was hindered by economic burdens and fear of pain. Additionally, the desire to have one’s end-of-life wishes respected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y members during end-of-life period emerged as key components of a good death. The predictive model identified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nd-of-life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family member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dispel misconceptions about existing end-of-lif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초록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이용 의향에는 경제적 부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존중,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좋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및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웰다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족·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생애 말기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Lee, Han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hin, Eunkyoung(Dankook University) ; Cho, Hwir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283-30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83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te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service planning and needs assessment by analysing the content of personal budget plans and actual expenditures among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pilot simulation project for personal budgets in Korea. By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plans of 90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withdrew from the project,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plans and expenditures were based on expressed needs, and identifies reasons for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spending. The data analysed include personal budget plan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cords. Participants expressed needs across a variety of domains, including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housing, care and support, mental health, and education and childcare. However, budget allocation was largely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and housing, with no planning observed in the remaining domains. In terms of expenditures, 65.5% of total spending was directed toward physical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followed by daily living and hous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allocations or spending stemmed from limited eligible uses, needs that could not be addressed through purchasable services, restricted budget amount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personal budgets to effectively realise personalisation and self-dire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eligible services based on core principles,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udget rules, and strengthen case managers’ competencies in planning and resource coordination.
초록
이 연구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실제 지출을 분석하여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참여자 90명의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출 여부, 예산 지출이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는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보호 및 돌봄, 정신건강, 보육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주로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출 내역은 전체 예산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었다. 욕구와 예산 편성·지출 간 불일치는 구매 가능한 용도의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예산제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 기반의 지원 항목 확대, 급여 범위의 유연화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Jang, Soo Mi(Cheongju University) ; Nam, Eunji(Incheon National University) ; Lee, Su ji(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05-33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05
Abstract
Diabetes requires self-management in daily life, not only through regular medical check-ups but also through medication and insulin injections, dietary control,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However, for low-income individuals with diabetes, various psychosocial difficulties often hinder effective self-management,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upport from medical social 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e experiences of medical social workers who work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in order to identify practical and policy strategies to support this popul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 medical social workers with practical experience work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ur focus group interviews and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yielded four main themes: (1) Low-income diabetes patients with complex challenges—pathways and reasons for intervention; (2) Contents of medical social work practices for low-income diabetes patients; (3) Practic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and (4) Structural challenges in intervening with low-income diabetes patients. These themes were further broken down into 16 categories and 257 concep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support strategies such as motivation-enhancing counseling, tailored welfare service, improvements to the insurance fees system, strengthening medical social workers’ competencies, and enhanced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초록
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약물 및 인슐린 주사,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소득 당뇨병환자들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을 심층 탐색함으로써, 저소득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저소득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천 경험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15명으로, 총 4회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 6단계에 의해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경로와 이유,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내용, 저소득 당뇨병환자 개입의 어려움: 실천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4개 주제, 16개의 범주, 257개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동기 강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수가체계 개선, 의료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Lee, Jincheol(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37-35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37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gion, housing, jobs, and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ng adults, with a focus on regional inequality in access to key resources. Using data from Youth Panel 2007, the study finds that only young adults in metropolitan cities have significantly higher intentions than those in provincial areas. The likelihood of home ownership is lowest in Seoul, followed by the capital region and metropolitan cities, while the likelihood of renting shows the opposite pattern. Among housing types, only rental hous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rriage intentions. Full-time employment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marriage intentions, but access to such jobs is more limited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In the path analysis, total effect reflects both the likelihood of securing resources and the impact of those resources on marriage intention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vailability and influence of key resources are structured differently across region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marriage intentions within the context of regional inequality.
초록
결혼에 있어 지역 간 자원 격차 상황은 ‘서울은 둥지(주거)가 없고, 지방은 먹이(일자리)가 없다’는 비유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2007(YP2007)을 바탕으로 지역, 주거, 일자리와 결혼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통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도(道) 지역 대비 광역시 청년이 결혼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거 측면에서 자가 독립 가능성은 도 지역 대비 서울, 수도권, 광역시 순으로 어려웠으며 임차 독립 가능성은 반대 순서로 나타났다. 이 때 임차 형태로 독립한 경우만 결혼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미취업 대비 결혼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은 도 지역 대비 서울과 광역시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 마련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념과는 달리 서울이 상대적으로 둥지를 구하기 수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먹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자원-결혼 의향 경로의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道) 지역은 자원 개선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는 일자리와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이 개선된 경우 오히려 결혼 의향이 낮은 현상을 보였다. 특히 광역시는 타 지역 대비 높은 결혼 의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둘러싼 지역 간 자원의 조건과 영향력이 사회적 통념과 달리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결혼을 지역 불균형 맥락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Lee, Sewon(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58-38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58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A) under Korea’s Child Welfare Act, which remains focused o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proposes a conceptual reconstruction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child maltreatment (CM), which includes neglect.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one type of neglect—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Korea and has been absorbed into or omitted from the practical,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udy compares international frameworks—including those of the WHO, the U.S., and the U.K.—with Korea’s legal definitions, administrative manuals, and databases.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 still treats neglect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child abuse rather than an independent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 remains unrecognized as a distinct rights viol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which centers on intentionality and visibility in determining ab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Article 3, 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to specify neglect as a parallel concept to abuse, explicitly including emotional neglect alongside physical neglect. This revision would help establish consistent intervention criteria for practitioner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suffering from emotional neglec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Korea’s child protection framework to recognize emotional neglect as an independent rights violation.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가 제도 도입 초기의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child abuse(CA)’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방임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 개념인 ‘child maltreatment(CM)’으로의 개념 재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실무·통계·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정서학대에 흡수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정의, 미국 CAPTA, 영국 교육부의 실무지침 등 국제적 규범 및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 매뉴얼 및 행정DB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방임을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은 고의성과 가시성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해 방임을 아동학대와 병렬된 개념으로 병기하고, 물리적 방임과 함께 정서적 방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가시적 방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실무자의 일관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Ahn, Lira(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82-399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382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conomic factors 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nd examined how social perception variables―such as views o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perceptions of fairness―mediate this relationship. Data from the 2022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were used, and a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S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fertility intentions of 3,070 young adults aged 19 to 36 residing in Seoul.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economic factors, both higher personal income and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intending to have children. Notably, parental economic status had a stronger effect than personal income. Second, individuals with a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those who perceived society as fair were more likely to express fertility intentions. Third, perceptions of the future mediated the effect of personal income and parental economic status on fertility intentions. Higher income and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ere linked to more positiv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which in turn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tending to have children. Fourth, perceptions of fairnes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al economic status on fertility intentions.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s of societal fairness, which positively influenced fertility intentions.
초록
이 논문은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 미래전망 및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GSEM)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 중 청년의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증가했다. 청년의 개인소득보다 부모의 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증가했다. 셋째, 한국사회 미래전망은 청년의 개인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넷째, 공정성 인식은 부모의 경제수준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Hwang, Jae Min(Jeonbuk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00-418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0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aily life restrictions on depression among people who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s adul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analysis used data on 644 adults who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fter age 20, drawn from the ‘2022 Panel Survey on Disability Life’ conducted by th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and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daily life restrictions negatively impacted self-esteem; (2) daily life restric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3) daily life restrictions influenced depression both directly (effect=0.378) and indirectly via self-esteem (effect=0.089), demonstrating a partial mediation effect. This study is academ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s of daily life restrictions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adults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finding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customized policies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reducing depression and enhancing self-esteem in this population.
초록
본 연구는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644명을 선별하였다. 분석은 SPSS와 Process Macro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첫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78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0.089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및 개입 프로그램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ee, Kyongjae(Yonsei University)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19-44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19
Abstract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dominant approach that has framed Aging in Place (AIP) primarily as a policy objective, often overlooking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this study developed the Scale of Aging in Place (SAIP), a systematic measurement tool designed to capture the lived experiences of aging in place. Grounded in environmental gerontology and drawing on qualitative data from previous research, the study identified key dimensions and elements of the AIP experience and constructed a preliminary 27-item scale to measure them.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was conducted with 1,026 older adults aged 55–75 across South Korea. Through factor analyses and subsequent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a 22-item, five-factor model—comprising a sense of autonomy, connectedness, self-continuity, convenience and safety, and stuckness—was finalized as the SAIP. With strong theoretical coherence, the SAIP captures the multidimensional experiences that older adults construct in their central life space of home and community, and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ssessing the realization of AIP ideals and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y interventions. In doing so, it contributes to both the advancement of empirical research and the enhancement of policy relevance in AIP practice.
초록
본 연구는 Aging in Place(AIP)를 정책적 지향으로 다루면서도 노인의 주관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cale of Aging in Place(SAIP)를 개발하였다. 우선, AIP를 노인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총체적 현상으로 정의한 뒤, 환경노년학에 기반해 경험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행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진술을 정리하여 27개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55-75세 고령자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자율감, 유대감, 자아연속감, 편의안전감, 체념의 5요인 22문항 구조의 SAIP를 확정하였다. SAIP는 노인이 나이 들어가며 삶의 중심이 된 공간에서 구성하는 경험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P 이념의 실현 정도와 관련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AIP 연구의 경험적 토대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Lee, Eunyoung(Donggu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43-46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4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who provide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services, such as IoT devices and AI care robots, to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such services.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social workers delivering digital care services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four key themes: (1)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digital care services in practice, (2) the expansion of social workers‘ roles and increased workload, (3) acceptance barriers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the use of digital care technologies, and (4)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This includes establishing digital ethics training and practice guidelines for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building a dedicated workforce and operational systems to manage care devices beyond regular working hours.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IoT, AI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분석에 기반해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현장 적용과 영향, 사회복지사 역할 확대와 직무 부담, 디지털 돌봄 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수용 한계와 윤리적 고려, 디지털 돌봄 서비스 운영상의 제도적 한계 등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디지털 윤리 교육과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시간 이후 디지털 돌봄 서비스 기기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 인력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ark, Sang gyun(Gachon University) ; Lim, You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67-49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67
Abstract
Regional disparities in the medical workforce constitute a structural issue that can undermin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quity. However, comparative evidence on work enviro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hospital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workforce imbalance by analyzing employee perceptions. A total of 4,537 reviews from JobPlanet, covering five metropolitan and 18 non-metropolitan tertiary hospit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Python-bas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 the categories of strengths, weaknesses, and sugg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etropolitan hospitals were associated with favorable perceptions, particularly regarding compensation, clinical exposure, and training systems. In contrast, non-metropolitan hospitals were linked to negative perceptions, including heavy workloads, hierarchical culture, and lower pa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actice location decisions among healthcare personnel are shaped b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individual preference alone. By utilizing experience-based qualitative data,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structural drivers of workforce maldistribu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training reforms and targeted regional retention incentives.
초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분포 문제를 넘어, 의료 접근성 저하와 건강 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원 근무 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인력 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의료 종사자의 근무 인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리뷰 플랫폼 ‘잡플래닛’에 게시된 수도권 5개 및 비수도권 18개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의 리뷰 4,537건을 수집하였으며, ‘장점’, ‘단점’,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항목을 중심으로 Python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높은 보상 체계, 다양한 임상 경험, 체계적인 수련 환경 등을 장점으로 언급한 반면, 비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 수직적인 조직문화, 낮은 보상 수준 등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의료인의 근무지 선택이 단순한 개인 선호를 넘어 병원 구조와 제도, 근무환경의 질적 차이에 기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실제 경험이 반영된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수련 체계 개편, 지역 근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증적 함의를 제공한다.
Lee, Jinyoung(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92-5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492
Abstract
Fraud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raud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397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aud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marital status. Second, having a spou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fraud victimization and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the negative impact of victimization was greater among individuals with a spouse. Finally,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level, frequency of online activit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trust in the police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while disability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the recovery process following fraud victimiz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ssist victims in thei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해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3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기 피해 경험과 배우자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온라인 사용 빈도, 이웃과의 상호작용, 경찰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피해 이후 개인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재정적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Lee, Hye-Jae(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Jung, Young-Il(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Hwang, Inuk(The Seoul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511-53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511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individual risk-taking propensity and MBTI personality types on the ownership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using the 2023 Insurance Consumer Behavior Survey data.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socioeconomic factors and risk aversion, this study measured risk-taking propensity through three approaches: a direct self-reported question, a lottery-based behavioral score, and cryptocurrency investment experience.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with the ownership of indemnity-type and fixed-benefit PHI as dependent variables, incorporating the four MBTI dimensions (I-E, S-N, T-F, J-P)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irect measures of risk-taking propens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wnership of indemnity-type PHI, while the direct self-reported measure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risk-taking propensity and fixed-benefit PHI ownership. Regarding personality types, individuals with a sensing (S) type were more likely to own indemnity-type PHI, whereas those with an extraversion (E) type were more likely to hold fixed-benefit PHI.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understanding of insurance consumer behavior by incorporating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thereby providing insights into the underlying motivations behind PHI ownership in Korea.
초록
이 연구는 2023년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위험감수 성향과 MBTI 성격 유형이 민간의료보험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위험회피 성향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직접 문항(자기보고식)과 간접 문항(복권 게임, 가상자산 투자)의 세 가지 방식으로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고, 성격 특성을 MBTI 4가지 차원(외향–내향[E–I], 감각–직관[S–N], 사고–감정[T–F], 판단–인식[J–P])으로 투입하여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보유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권게임 점수와 가상자산 투자 경험으로 측정한 위험 감수 성향이 실손형 보험 보유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 보험에서는 위험 감수 성향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MBTI 성격 유형이 감각형(S)인 사람은 실손형 보험 보유 가능성이 높았고, 외향형(E)은 정액형 보험 보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성향 및 성격 요인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보험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의 성격 요인에 따른 정보 접근성과 보험 선택 편차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 정보 제공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Lee, Ga Hyun(Sungkyunkwan University) ; Han, Chang-Keun(Sungkyunkw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533-55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533
Abstract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youth policies addressing housing, poverty, and employment, economic hardship and loneliness among young adults continue to worse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ousing- and food-related difficulties among young adults. Housing functions as a framework through which individuals understand their lives and society, while dietary practices within residential spaces are closely related not only to the housing environment but also to economic background, influencing young adults’ emotional well-being.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neliness is mediated by food security and the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subjective income level. This study found that the mediational effect of food security is supported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ubjective income level is significant.
초록
청년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빈곤, 고용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어려움 중 주거와 식사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하며,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1인가구 청년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이 식품미보장을 매개로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환경, 외로움, 식품미보장 사이의 직·간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활용되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미보장은 주거와 외로움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소득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주거환경, 식품미충족, 외로움과의 관계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Daehwan(Dong-A University) ; Jeong, Jungyoung(Dong-Eu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558-5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558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the adequacy and the methods of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pproach leveraging the unexpected external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the 7th to 10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Study (KReIS), our analysis yielded three main findings. First, older adul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prepared sufficiently for old age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 had not. Seco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ife satisfaction declined sharply among all groups of older adults. Third, individuals who prepared for old age primarily through public pensions (National Pension) maintained relatively higher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pandemic, whereas those who relied on alternative means (e.g., asset accumulation) experienced substantial declines comparable to those without prepar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old-age preparation in Korean society, which faces rapid population aging, high elderly poverty rates, low life satisfaction, and extended retirement periods. Above all, the results highlight not on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adequately for old age, but also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stable stream of income until the end of life.
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와 노후 준비 방법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내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인 COVID-19를 활용해 이중차분법을 도입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7~10차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첫째,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두 그룹의 고령자 모두 삶의 만족도가 많이 감소했다. 셋째,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한 사람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했지만, 다른 방식(예, 자산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낮은 삶의 만족도’, ‘은퇴 기간의 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를 위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Hyeon, Ockj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Byun, Geumsun(The Seoul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578-599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578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dolescent poverty on stable employment in young adulthoo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poverty experienced at ages 15 and 18 and the likelihood of securing stable employment between ages 19 and 34. Household poverty status during adolescence was measured using data from 3rd to 10th waves (2000-2007), while employment outcomes were tracked from 7th to 26th waves (2004-2023). Stable employment was defined based on employment status, hourly wages,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We employed a mixed-effects panel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youth who experienced household poverty during adolescence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find stable employment in young adulthood compared to their non-poor counterparts. Additionally,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ntry into stable employ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young adults' labor market outcomes are influenced by their household income status during adolesce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expanding income support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Policy interventions should also address structural barriers in the labor market to reduce employment instability and mitigate job quality disparities among young adults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기 가구빈곤 경험이 청년기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85-1989년생이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에 경험한 가구 빈곤이 19세부터 34세 시점에 관측된 졸업 후 초기(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하)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안정적 일자리는 주요 경제활동 상태, 시간당 중위임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측정하였다. 혼합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로짓분석 결과, 15세부터 18세까지 시점에 빈곤가구에 속했던 청년은 비빈곤 가구 청년보다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원가구의 빈곤이 자녀의 불안정 일자리 취업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에 관측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갖는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Kim, Su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600-62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600
Abstract
Usual source of care (USC) is a core component of primary healthcare which allows early detec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individual health. Beyo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USCs play a vital role in shaping preventive behaviors and promoting long-term health.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having a USC and weight status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Child Survey, we analysed a sample of 5,066 individuals aged 2 to 17 through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The findings show that children with a USC had significantly lower odds of being overweight or obese compared to those without. This suggests that continuity and comprehensiveness of care may contribute positively to healthy weight maintena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ddition,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level, and residential are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eight outcomes. In particular, children resid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or obese, while those living in mid-sized cities were less likely to be underweight. The study highlights that USC may function not only as a first point of contact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but also as a mechanism for fostering family trust, improving health information uptake, and supporting behavioral change. Our findings imply that, moving beyond one-off education or awareness campaigns, policy efforts should consider more structured and sustained interventions through primary care linkage with USC to enhance childhood weight management.
초록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의 핵심 요소로서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만성질환뿐 아니라 건강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체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예방적 기능과 생애주기적 건강관리의 정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17세 아동 및 청소년 5,066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과체중·비만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의 연속성과 포괄성이 성장기 적정체중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밖에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농어촌 거주 아동 및 청소년은 비만 위험이 높고 중소도시 거주 아동 및 청소년은 저체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이 단순한 보건의료체계 내의 최초 진료접점이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 건강정보의 수용, 생활양식 변화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교육이나 캠페인 중심의 전략을 넘어, 상용치료원과 연계된 일차의료 기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Baek, Ji Ye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 Her, Wonbin(Pukyong National University) ; Oh, Young Sam(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622-65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62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practices in Photovoice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DBpia, KISS, RISS, and Google Scholar. Following the PRISMA-ScR guidelines, a final set of 69 studies was selected for a scoping review. The analysis focused on four criteria: the mode of public deliberation (offline, online, mixed), the target audience (internal participants, external audience, mixed), the agent of practice (researcher, participant, mixed), and the presence of a theoretical ba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offline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were the dominant modes of public deliberation. The target audience tended to be concentrated internally among participants rather than externally. Furthermore, the agents of public deliberation were predominantly researcher-centered. Regard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most studies did not explicitly present a theoretical basis, and studies grounded in specific theories were found to be very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 key phase in Photovoice research, identifying the current structure of practice. It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strategi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를 대상으로 공론화 실천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Bpia, KISS, RISS, Google Scholar를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PRISMA-ScR에 따라 최종 선별한 69편의 연구에 대해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공론화 방식(오프라인·온라인·혼합형), 공론화 대상(참여자 내부·외부·내부와 외부), 공론화 실천 주체(연구자·참여자·혼합형), 그리고 이론적 기반 제시 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론화 방식은 오프라인 전시와 발표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론화 대상은 외부보다는 참여자 내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공론화 실천 주체는 연구자 중심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론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연구가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론을 토대로 수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핵심 단계인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실천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및 실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Maeng, Shin Sil(Dankook University) ; Jeon, Hye Seong(Dankoo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652-67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652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rends and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research on metaverse counseling to propose future possibilitie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eight academic studies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metaverse counseling published in Korea up to June 2024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taverse counseling was implemented across various age groups and topics, with a primary focus o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The platforms utilized included METAFOREST, ZEP, and Mindvridge. Both group and individual counseling modalities were applied, employing approaches such a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and solution-focused therapy. The methodology predominantly involved quantitative and mixed-methods designs. Second, the effectiveness of metaverse counseling was examined in two distinct categories: the effects of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the effects of metaverse itself. Counseling interventiona demonstrated outcomes such as improvement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metaverse-specific effects included anonymity, presence, and immer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otential of metaverse counseling and direc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proposed.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메타버스 상담의 연구 동향 및 효과성을 확인하여 향후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시작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메타버스 상담’ 및 ‘메타버스 심리치료’를 키워드로 한 총 8편의 메타버스 상담 효과성 관련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연구동향과 효과성’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동향 결과로, 메타버스 상담대상은 주로 청소년 및 대학생이 많았으나 연령별로 다양하였다. 상담주제는 대인관계, 학업, 취업, 스마트폰 과의존, 교사의 심리적 소진,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하였고, 활용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메타포레스트, ZEP, 마브의 3가지였다. 개입방법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이 적용되었고, 적용이론으로는 인지행동치료 및 해결중심치료 등이었다. 연구는 양적 및 질적, 혼합연구로 진행되었다. 둘째, 메타버스 상담 효과성 결과로, ‘상담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메타버스로 인한 효과’로 각각 제시되었다. 상담 개입효과는 대인관계 향상, 스마트폰 과의존성 해소, 학급 응집력과 공감 능력 향상, 일상생활 정신건강 개선, 게임 리터러시 상승 및 게임조절력 향상, 자기 인식 및 자기반성 촉진, 청소년 비행정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로 인한 효과는 아바타를 통한 익명성, 실재감, 흥미를 통한 몰입감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상담의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