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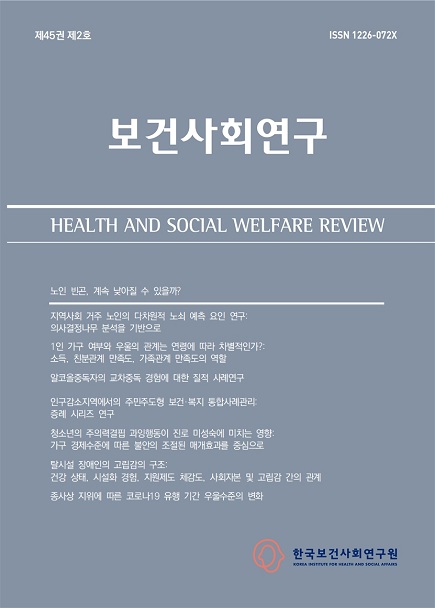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종별 비교
The Impact of Longest-Held Job in Lifetime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Older Adults: Comparing Occupation
Chang, Sung Hyu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171-190,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17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근로직종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고령자 정책에서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을 연계 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장기 종사 직종에서 일하는 노인의 만족도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가 직종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에는 최장기 근로직종이 일치했다고 해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종에 따라 퇴직 후 같은 직종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노동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종사 노인과 같은 퇴직 전문인력을 세분화하여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별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취업 노인이 어느 직종에서든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longest-held job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elderly individuals, comparing different occupations.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analyz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employed seniors who remained in their longest-held job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Second, elderly workers in professional, managerial, administrative, and service/sales occupation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when they continued working in their longest-held job. On the other hand, for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craft/equipment operation, and elementary occupation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ontinued engagement in the longest-held job and job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uitable employ ment opportunities and labor policies for the elderly, leveraging their lifetime work experience.
초록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23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 매칭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노동경력을 활용한 고령자 노동정책과 적합직종 발굴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Ⅰ.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어느새 1000만 명에 도달하였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 수명이 증가하며,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4a). 80세 이상 근로 노인을 칭하는 ‘옥토제너리언(Octogenerian)’도 60~70대 노인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저출산이 심화되어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고령인력의 활용도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과 각종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들을 실시하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79세 이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2%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15%)의 두 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4b).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다른 연령대의 취업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노인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 노인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21.5%) 및 보건사회복지 종사자(17.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c). 이는 기존 연구(지은정, 201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령 일자리가 여전히 일부 산업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일 연령대 노인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단순노무종사자(34.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1.0%), 서비스판매 종사자(18.0%),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6.4%)로 제시되고 있다(통계청, 2024c).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노무종사직, 농림어업 종사직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판매 종사자 및 기능기계조작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생계형 노동에 참여한 과거 노인과는 달리, 고학력, 고숙련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라 불리우는 신노년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신노년층은 학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현상과 더불어 일자리를 통한 직업적 노하우를 축적하여, 고령층 경력 개발 형태의 변동을 시사한다(안준기, 김은석, 2022). 이들은 ‘파워시니어’ 로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이철희, 2024), 중고령층(55-64세)에서도 퇴직 후 서비스직, 사무직 및 전문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김문정 외, 2023)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노인의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 노인의 근로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지표로는 ‘직무만족도’를 꼽을 수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Locke, 1969),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취업 노인의 생활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동배 외, 2009). 이처럼 직무만족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Judge & Watanabe, 1993; Rain et al., 1991; Rice et al., 1985; Rode, 2004; Tait et al., 1989), 삶의 만족도에 직무 외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점(Rode, 2004; 성지영 외, 2017에서 재인용)에서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해 주목하였다.
취업 노인의 직무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왔다(김동배 외, 2009; 강소랑, 문상호, 2010; 김현동, 성상현, 2010; 이정의, 2011; 한종국, 2016; 임승준 외, 2021; 성지영 외, 2017; 허준수 외, 2019; 조완신 외, 2020). 이 연구들은 대상자의 연령을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령자 및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근무형태, 근로시간이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마다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노인의 노동은 노동궤적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이행되고 있는데(홍백의, 김혜연, 2010; 박경하, 2011; 이승호 외, 2019; 양정승, 2021 등), 공통적으로 근로생애 시기 직업 및 경제활동 상태가 고령층 경제활동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퇴직 전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퇴직 후 일자리로 유지될 경우, 생산성이 유지되며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Cole, 1979), 연령과 관계없이 전문직이라는 정체성을 지닐 경우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Acker, 2004). 이는 장년기에 활동했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지속이론과도 관련이 있다(Kiyak & Hooyman, 1999). 또한 개인-직무 적합 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적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강소랑, 문상호, 2010; 성지영 외, 2017; 허준수 외, 2019; 임승준 외, 2021), 취업 노인의 경우에도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생애과정 및 지속이론을 근거로 제시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직무 적합 이론의 ‘직무적합’은 근로생애 경험에 의해 축적한 역량 및 기술이라는 가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의 변수를 활용하여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 노인의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허준수 외, 2019), 최장기 근로직종과 직종별 직무만족도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근 노인 일자리의 동향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종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논의
1.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 개념 및 현황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오랜 기간 여러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대표적으로 Locke(1969)는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즉 직무만족도는 자신의 직무, 직무수행, 직무환경에 대해 느끼는 정도로 볼 수 있으며(Weiss & Cropanzano, 1999), 조직 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등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나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Judge & Kammeyer-Mueller, 2012). 또한 직무만족도는 근로환경의 복합적인 측면이 반영된 개념으로서(Lichtenstein, 1984), 개인이 맡은 직무 성격 및 상황에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Hackman, 1980). 이외에도 이홍직 외(2019)는 대표적인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해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직무만족 개념 정의
| 학자 | 정의 |
|---|---|
| Locke(1969) | 개인이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형태로 직무평가나 직무경험에서 얻어지는 감정적 감정 및 즐거움 |
| Smith et al(1983) |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좋고 싫은 감정의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되는 태도 |
| Porter(1961) | 직무수행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대성과와 보상받은 성과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 |
| Vroom(1995) | 직무에 관한 개인의 정서성향(affective orientation) |
| Spector(1997) | 직무에 관한 성취감, 자아실현과 같은 비경제적인 만족/직무수행에 따라 부여되는 급여나 근무조건과 같은 보상가치 |
| Vecchio(2002) | 직무에 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기대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개인의 경험 |
출처: “임금노동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홍직, 윤수인, 최순례, 윤승태, 2019, 생명연구, 52, pp. 85-107.
국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조직 구성원이 직무 및 조직 내의 상황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한 정서적 반응의 상태로 정의한다(옥원호, 김석용, 2001). 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직무, 직장과 관련하여 놓여있는 내적, 외적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심리 현상적 요인이 맞물리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선영, 김범중, 2020). 또한 직무만족도는 직업만족도, 일자리 만족도와 혼용하여 쓰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전혜영, 2019). 이를 종합하면, 직무만족도는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직무 및 직무환경에 대해 지각하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집단으로 살펴보는지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31.4%)으로 나타났다(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2021).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이외에도 대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직무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하경분 외, 2014; 김준수 외, 2021; 권영혁, 변상해, 2022 등). 그러나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 고령자 직종은 상당수 분포하고 있고, 지은정(2017)은 고령 임금 근로자 중 청소와 경비 업무에 편중되어 열악한 상황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숙련·고학력 취업 노인세대가 등장하면서 직종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건강수준)과 경제적 변인(소득,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취업 노인의 성별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나,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성별은 고령 남성에 비해, 고령 여성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의, 2011). 55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성별은 직무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5-74세 고령 근로자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지영 외, 2017).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경우, 남성의 일자리 만족도 증가율이 여성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조완신 외, 2020). 아울러, 56세 이상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성별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준 외, 2021). 한편 55세 이상 건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김동배 외, 2009)와 65-74세 1인 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허준수 외, 2019)에서는 성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연령은 대체로 고령층 내에서도 후기연령대가 전기연령대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와 55-74세 고령 근로자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의, 2011; 성지영 외, 2017), 56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령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준 외, 2021). 다만 65-74세 1인 취업 노인의 경우, 연령은 직무만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시된 점(허준수 외, 2019)은 두 변수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Kacmar & Ferris(1989), 김동배 외(2009)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청년기 취업 이후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다가 은퇴 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곡선관계를 보이는 결과도 나타났다(Clark et al., 1996).
취업 노인의 교육수준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이정의 외, 2011)와 건강한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김동배 외, 2009)에서는 교육수준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5-74세 고령 근로자 및 56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성지영 외, 2017; 임승준 외, 2021), 반대로 65-74세 1인 취업 노인 및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수 외, 2019; 조완신 외, 2020).
취업 노인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의, 2011). 55-74세 고령 근로자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성지영 외, 2017).
취업 노인의 임금수준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도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 55-74세 고령 근로자의 근로소득, 56세 이상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랑, 문상호, 2010; 성지영 외, 2017; 임승준 외, 2021). 하지만 56세 이상 비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직무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승준 외, 2021). 취업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규직이나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외, 2009; 임승준 외, 2021; 성지영 외, 2017). 이외에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직무만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김동배 외, 2009), 최근 자료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전일제보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4b).
결국,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취업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소득,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분석된 모형 및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직무만족과 관련된 다변화, 정교화된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강소랑, 문상호, 2010),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승준 외(2021)는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간 고령화 직무 특성을 구별하지 않았고, 이정의(2011)는 기술 수준 대비 직무 수준으로 살펴보았으나 저숙련 및 고숙련 일자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종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혼인상태, 조직몰입도, 행복 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변수에 투입되었지만, 고령층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성지영 외, 2017; 허준수 외, 2019),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3.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 개인-직무 적합 이론(Person-Job fi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애 과정 이론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 상태, 사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생애에 걸쳐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사회구조에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Mayer, 2018). 생애과정은 단일 개인의 사건 역사로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집합적인 수준, 문화 자체의 속성, 역사적 시기, 민족 국가 간 비교로도 볼 수 있다(Settersten Jr & Mayer, 1997). 따라서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과 현 근로직종의 유사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근로생애(15-64세)의 노동궤적이 노년기 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과 현 근로직종 사이에서 근로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과거 최장기 근로직종이 현 근로직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통계청, 2024a). 또한 퇴직 전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퇴직 후 일자리로 유지될 경우, 생산성이 유지되며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Cole, 1979). 이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이 현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직무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지속이론은 각 개인이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개인의 고유한 특성 및 활동 경험이 노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에 무조건 참여 하기보다, 장년기에 활동했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유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Kiyak & Hooyman, 1999). 이는 노년기의 행동이 과거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경험을 쌓은 점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과도 이어진다(권미애, 김태현, 2008). 지속이론의 관점에서 취업 노인의 과거 근로경험, 특히 최장기 근로했던 직종이 현 근로직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은 생애노동경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직무 적합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지은정, 2017). 개인-직무 적합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개인-환경 적합 이론(Person-Environment fit)중 하나로 분류되며(Sekiguchi, 2004), 조직구성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의 요구와 직무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Edwards, 1991). 개인-직무 적합도가 높을수록 근로자의 조직몰입 수준이 높아지고, 조직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추고(Memon et al., 2015), 긍정적인 업무태도로 제시되었으며(Yen & Ok, 2011), 근로자의 직업성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June & Mahmood, 2011). 다만 특정 직종에서 최장기로 종사했다고 해서 개인의 직무적합도가 높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개인이 직무와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이유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취업 노인이 청장년기 종사한 직업에서 축적한 역량, 지식, 기술 등은 노년기 근로직종에 필요한 업무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상단의 세 이론으로 모형을 입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Quinn et al., 1990; 장지연, 2003; 홍백의, 김혜연, 2010; 박경하, 2011; 이승호 외, 2019; 양정승, 2021; 백옥미, 2014; 강소랑, 문상호, 2010; 한종국, 2016; 성지영 외, 2017; 임승준 외, 2021). 먼저 생애과정 접근으로 노동궤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주로 군집분석을 통해 근로 유형별 집단을 분류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상태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Quinn et al(1990)은 고령층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전일제 고용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국내연구에서 장지연(2003)은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경우, 상용근로상태에서 전문직과 사무직은 임시일용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생산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백의, 김혜연(2010)은 정규 퇴직형 집단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단의 경제적 상태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지속근로자형, 지속자영자형, 지속근로자형 등의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박경하(2011) 의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 중 재진입제약형, 주변적 경제활동형, 퇴장 후 재진입형이 확인된다. 재진입제약형의 경우, 은퇴과정에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가장 불평등한 상태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성을 보이는 주변적 경제활동형에서는 고용상태의 여러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고, 퇴장 후 재진입형에서는 비임금근로 지속기간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승호 외(2019)는 15-50세의 근로생애기간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일 경우 중고령 시기에 가교일자리, 점진적 은퇴 유형에 속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일을 일찍 시작할수록 중고령기에도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양정승(2021)은 55-64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종사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동일한 직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지만,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현재 일자리에서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취업 노인의 근로직종 및 경제적 상태는 근로생애 시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로생애 시기 불안정한 근로경험이 취업 노인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속이론을 토대로 백옥미(2014)는 노년기 노동시장의 참여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년 동안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근로생애 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취업 노인의 지속적인 노동의 효과성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이론에 따라 지은정(2017)도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과 현 근로직종이 일치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고령자의 근로생애기간을 바탕으로 축적된 직무적합 여부와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강소랑, 문상호 (2010)는 45세 이상 장년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인력 직무 특성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과 비슷한 정도가 높을 경우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정의(2011)는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무요구도와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지영 외(2017)는 55-74세 고령층에 대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최장기 근로직종과의 기술적합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허준수 외(2019)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및 기술수준 등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준 외(2021)는 56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용직근로자와 비상용직 근로자 모두 직무적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마다 대상자의 연령이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 및 노인이 직무를 적합한 것으로 여길 경우,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는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취업 노인의 직종에 따라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로써 전국대표성을 가진 조사이다. 표본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에서 2010년 당시 만 61세 이상인 노인을 모집단으로 층화한 후 제곱근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여타 조사자료보다 한국 노인의 생활 현황과 변화 추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세진 외, 2021). 또한 최근의 노인 일자리 동향이 반영되었고 표본의 수도 상당수 확보되어 본 연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65세-74세의 전기노인에 고등교육 및 숙련 기술을 축적한 신노년층이 포함되고,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에 비해 근로의지가 있고 건강하다는 점에서(최희정, 2018),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취업기준인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이다. 본 연구는 상기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하고 직접 조사에 응답한 취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측치 제거 후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총 1,00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변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이다. 직무만족도를 “현재 하시는 일자리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 에서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이다. 이를 “현재 하시는 일이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입니까?” 질문의 예/아니요로 측정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종에 대해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한다. 다만, 노인이 취업중인 직종의 성격 및 편포를 고려하여, 서비스직과 판매직을 서비스·판매직으로,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을 관리·전문·사무직으로, 기능직과 기술직을 기능·기술직으로 각각 통합하고, 농림어업과 단순노무직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기술직,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근로시간, 근로사유, 종사상 지위, 직종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구성
| 변수명 | 세부사항 | ||
|---|---|---|---|
|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 아주 불만족 ~ 아주 만족 (1~5점) | |
|
|
|||
| 독립변수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현 직종이 최장기 근로직종인 경우 1 | |
|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 0 | |||
|
|
|||
|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 남 1, 여 0 |
|
|
|||
| 연령 | 만 나이 | ||
|
|
|||
| 교육수준 | 고졸 이상 1 | ||
| 고졸 미만 0 | |||
|
|
|||
| 건강상태 | 아주 불만족 ~ 아주 만족 (1~5점) | ||
|
|
|||
| 일자리 특성 | ln월평균소득 | 취업 노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단위: 만 원) | |
|
|
|||
| 근로시간 | 현재 하는 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 ||
|
|
|||
| 근로사유 | 생계비 마련(+용돈마련) 1, 비생계비 마련 0 | ||
|
|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1 | ||
| 고용주 2 | |||
| 자영업자 3 | |||
| 무급가족종사자 4 | |||
| 임시일용직 0 | |||
|
|
|||
| 직종 | 서비스판매직 1 | ||
| 농림어업 종사직 2 | |||
| 기능기술직 3 | |||
| 단순노무직 4 | |||
| 전문관리사무직 0 |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종별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Rosenbaum and Rubin(1983)이 제안한 성향점수 매칭 모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매칭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분석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균형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균형이 달성될 경우 하위집단 및 일대일 매칭으로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향점수 추정에 관해서는,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로짓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추정하였다. 이어서 실헙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관측치마다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 값을 매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짝짓기하고, 20, 40, 60, 80 백분위 수 지점에서 표본들을 나누어 총 다섯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공통영역의 가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양 집단 간 중복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은 각 하위집단별 특정화 검정을 수행하여 균형이 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위집단들의 균형이 달성되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결과변수의 차이를 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효과 추정치를 구하였다. 하위집단 수행이 마무리되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관측치를 최소거리법(minimum distance method)에 따라 일대일 매칭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TATA 18을 이용하며, 연구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성향점수 매칭 이후, 취업 노인의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의 일치 여부가 직종별(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종사직, 기능·기술직, 단순노무직)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취업 노인은 총 2,0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 일이 최장기 종사 직업인 노인은 1,474명(72.0%), 현재 일이 최장기 종사 직업이 아닌 노인은 573명(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노인 중 생애노동경력과 유사한 일을 하는 노인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였다. 즉 각 개체의 성향점수를 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결과, 각 집단에서 500명이 선정되었다. 아래의 <표 3>은 동질화된 두 집단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평균 차이 및 기초통계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취업 노인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구분 | 집단유형 | 집단 간 차이검증 (chi) | 직무만족도 |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t, chi) | |
|---|---|---|---|---|---|---|
| 실험집단 | 비교집단 | |||||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여 | 500 (50.0) | 500 (50.0) | 3.72 | -2.55* | |
| 부 | 3.61 | |||||
| 연령 | 65-69세 | 479 (95.8) | 476 (95.2) | .2094 | 3.67 | .47 |
| 70-74세 | 21 (4.2) | 24 (4.8) | 3.62 | |||
| 성별 | 남 | 227 (45.4) | 233 (46.6) | .1449 | 3.66 | .27 |
| 여 | 273 (54.6) | 267 (53.4) | 3.67 | |||
| 교육수준 | 고졸 이상 | 267 (53.4) | 259 (51.8) | .2567 | 3.70 | -1.84 |
| 고졸 미만 | 233 (46.6) | 241 (48.2) | 3.63 | |||
| 건강상태 | 보통 이상 | 465 (93.0) | 465 (93.0) | 3.69 | 4.69*** | |
| 보통 미만 | 35 (7.0) | 35 (7.0) | 3.31 | |||
| 월평균소득 | 20만 원 미만 | 61 (12.2) | 38 (7.6) | 77.06*** | 3.58 | 16.4* |
| 20만~50만 원 | 34 (6.8) | 83 (16.6) | 3.70 | |||
| 50만~100만 원 | 34 (6.8) | 64 (12.8) | 3.54 | |||
| 100만~150만 원 | 39 (7.8) | 52 (10.4) | 3.66 | |||
| 150만~200만 원 | 54 (10.8) | 83 (16.6) | 3.58 | |||
| 200만~300만 원 | 153 (30.6) | 130 (26.0) | 3.69 | |||
| 300만 원 이상 | 125 (25.0) | 50 (10.0) | 3.81 | |||
| 근로시간 | 10시간 미만 | 109 (21.8) | 148 (29.6) | 21.83** | 3.68 | .77 |
| 10~19시간 | 40 (8.0) | 44 (8.8) | 3.73 | |||
| 20~29시간 | 37 (7.4) | 52 (10.4) | 3.56 | |||
| 30~39시간 | 54 (10.8) | 68 (13.6) | 3.60 | |||
| 40~49시간 | 181 (36.2) | 132 (26.4) | 3.77 | |||
| 50시간 이상 | 79 (15.8) | 56 (11.2) | 3.48 | |||
| 근로사유 | 생계비 마련 | 433 (86.6) | 427 (85.4) | .299 | 3.64 | 2.86** |
| 비생계비 마련 | 67 (13.4) | 73 (14.6) | 3.81 |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90 (18.0) | 133 (26.6) | 95.56*** | 3.77 | 1.43 |
| 고용주 | 42 (8.4) | 17 (3.4) | 3.78 | |||
| 자영업자 | 227 (45.4) | 125 (25.0) | 3.65 | |||
| 무급가족종사자 | 55 (11.0) | 32 (6.4) | 3.56 | |||
| 임시일용직 | 86 (17.2) | 193 (38.6) | 3.61 | |||
| 직종 | 관리·전문·사무직 | 52 (10.4) | 44 (8.8) | 65.25*** | 3.72 | 8.57 |
| 서비스·판매직 | 180 (36.0) | 174 (34.8) | 3.67 | |||
| 농림어업 | 112 (22.4) | 54 (10.8) | 3.63 | |||
| 기능원·장치기계 조립종사 | 63 (12.6) | 34 (6.8) | 3.74 | |||
| 단순노무직 | 93 (18.6) | 194 (38.8) | 3.61 | |||
| 전체 | 500 (100) | 500 (100) | 3.67 | |||
먼저 취업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는 이분형 변수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5-69세인 집단이 실험집단에서는 95.8%, 비교집단에서는 95.2%로 나타났고, 70-74세 집단에서는 실헙집단 4.2%, 비교집단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5-69세 연령대가 70-74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실험집단에서는 45.4%, 비교집단에서는 46.6%로 나타났고, 여성이 실험집단에서는 54.6%, 비교집단에서는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실험집단에서는 53.4%, 비교집단에서는 51.8%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 미만이 실험집단에서는 46.6%, 비교집단에서는 48.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이 고졸 미만의 학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각각 93%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각각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건강한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유는 생계비 마련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실험집단에서는 86.6%, 비교집단에서는 85.4%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생계비 마련일 경우에는 실험집단에서는 13.4%, 비교집단에서는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 성향점수 매칭을 하였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월평균소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직종이었다. 실험집단의 월평균소득은 200만~3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취업 노인이 3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0만 원 이상(25.0%), 20만 원 미만(12.2%)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비교집단의 월평균소득은 200만~300만 원 구간이 2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만~50만 원 및 150만~200만 원 구간이 16.6%, 50만~100만 원 구간(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근로시간은 40-49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미만(21.8%), 50시간 이상(1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집단의 근로시간은 10시간 미만이 29.6%로 가장 많았고, 40~49시간(26.4%), 30~39시간(1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45.4%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18.0%), 임시일용직(17.2%) 등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집단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 38.6%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26.6%), 자영업자(2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22.4%), 단순노무직(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집단의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판매직(34.8%), 농림어업(10.8%)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6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근로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 직종이 최장기 근로직종인 경우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72점으로,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3.61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일 경우 직무만족도는 평균 3.69점으로, 보통 미만으로 응답한 노인의 직무만족도(3.31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81점으로 가장 높은 직무만족도가 나타났지만 50만~100만 원 소득자는 3.54점으로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가 나타났다. 비생계비 목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직무만족도(3.81점)는 생계비 목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직무만족도(3.6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보면, 성별과 월평균소득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수 간의 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만족도와 다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이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비생계 목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각각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직무 만족도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성별 | 연령 | 교육 수준 | 건강 상태 | 월평균 소득 | 근로 시간 | 근로 사유 | 종사상 지위 | |
|---|---|---|---|---|---|---|---|---|---|---|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08* | |||||||||
| 성별 | -.01 | -.01 | ||||||||
| 연령 | .02 | -.02 | .08* | |||||||
| 교육수준 | .06 | .02 | .21*** | -.30*** | ||||||
| 건강상태 | .24*** | .02 | .09** | -.13*** | .12** | |||||
| 월평균소득 | .09* | .19*** | .42*** | -.19*** | .36*** | .13** | ||||
| 근로시간 | -.04 | .12** | .25*** | -.17*** | .25*** | .18*** | .41*** | |||
| 근로사유 | -.09** | .02 | .002 | -.02 | -.04 | -.12** | .05 | .04 | ||
| 종사상 지위 | -.02 | .29*** | .10* | -.01 | .10** | .06 | .008 | .20*** | -.11*** | |
| 직종 | -.02 | -.14*** | .02 | .17*** | -.24*** | -.09** | -.27*** | -.20*** | .09* | -.35*** |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서 일을 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2, p<.01). 이외 취업 노인의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 건강상태, 근로시간, 근로사유, 종사상 지위(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높아질수록(B=.02, p<.05), 건강상태는 좋을수록(B=.23, p<.001), 근로시간은 짧을수록(B=-.00, p<.01), 근로목적의 경우 생계비 마련보다 비생계비 마련에서(B=-.13, p<.05),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B=.13, p<.05) 직무만족도는 한 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변수 | B | S.E | t | ||
|---|---|---|---|---|---|
| 독립변수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0.12 | 0.04 | 2.72** | |
| 통제변수 | 성별 (ref. 여) | -0.08 | 0.05 | -1.55 | |
| 연령 | 0.02 | 0.01 | 2.08* | ||
| 교육수준 (ref. 고졸 미만) | 0.07 | 0.05 | 1.56 | ||
| 건강상태 (ref. 보통 미만) | 0.23 | 0.03 | 7.49*** | ||
| log월평균소득 | 0.03 | 0.03 | 0.89 | ||
| 근로시간 | 0.00 | 0.00 | -3.31** | ||
| 근로사유 (ref. 비생계비마련) | -0.13 | 0.05 | -2.52* | ||
| 종사상 지위 (ref. 임시일용직) | 상용직 | 0.13 | 0.07 | 2.04* | |
| 고용주 | 0.09 | 0.10 | 0.88 | ||
| 자영업자 | 0.02 | 0.07 | 0.23 | ||
| 무급가족 종사자 | 0.01 | 0.16 | 0.05 | ||
| 직종 (ref. 단순노무직) | 관리·전문· 사무직 | -0.01 | 0.08 | -0.07 | |
| 서비스· 판매직 | -0.02 | 0.06 | -0.26 | ||
| 농림어업 | -0.03 | 0.08 | -0.32 | ||
| 기능원·장치 기계조립종사 | 0.05 | 0.09 | 0.62 | ||
| 상수 | 1.75 | 0.59 | 2.98 | ||
| N | 1,000 | ||||
| R 제곱 | .0971 | ||||
| F | 6.33*** | ||||
이어서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종별 직무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직종에 종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관리·전문·사무직의 경우,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서 일을 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43, p<.01). 또한 서비스·판매직의 경우에도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취업 노인이 최장기 직업에서 일을 할 경우 최장기 직업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8, p<.05). 이외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은 모든 직종이 아닌, 일부 직종에 한하여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취업 노인의 직종을 고려한 생애경력 연계에 대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표 6
취업 노인의 현 직종별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변수 | 관리·전문·사무직 | 서비스·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원·장치기계 조립종사 | 단순노무직 | |||||||
|---|---|---|---|---|---|---|---|---|---|---|---|---|
| B | t | B | t | B | t | B | t | B | t | |||
| 독립 변수 |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 0.43 | 2.99** | 0.18 | 2.58* | -0.01 | -0.06 | 0.19 | 1.08 | -0.0007 | -0.01 | |
| 통제 변수 | 성별 (ref. 여) | -0.12 | -0.79 | 0.00 | 0.01 | -0.15 | -1.03 | 0.03 | 0.09 | -0.12 | -1.21 | |
| 연령 | 0.05 | 1.66 | 0.02 | 1.24 | 0.01 | 0.29 | 0.02 | 0.9 | 0.01 | 0.92 | ||
| 교육수준 (ref. 고졸 미만) | 0.30 | 1.48 | 0.12 | 1.53 | 0.07 | 0.61 | 0.01 | 0.04 | -0.05 | -0.51 | ||
| 건강상태 (ref. 보통 미만) | .05 | 0.61 | 0.22 | 4.19*** | 0.26 | 3.21*** | 0.28 | 2.03* | 0.25 | 4.17*** | ||
| log월평균 소득 | 0.07 | 0.77 | 0.07 | 1.03 | 0.04 | 0.66 | 0.20 | 1.02 | -0.04 | -0.57 | ||
| 근로시간 | -0.01 | -1.31 | 0.00 | -1.29 | 0.00 | -1.18 | -0.01 | -1.57 | 0.00 | -1.47 | ||
| 근로사유 (ref. 비생계비 마련) | -0.17 | -1.29 | -0.19 | -1.97* | -0.05 | -0.43 | -0.09 | -0.59 | -0.19 | -1.33 | ||
| 종사 상 지위 (ref. 임시 일용직) | 상용직 | -0.15 | -0.63 | 0.15 | 1.37 | 0.78 | 1.12 | -0.04 | -0.17 | 0.21 | 2.16* | |
| 고용주 | -0.19 | -0.6 | -0.04 | -0.27 | 0.77 | 0.96 | -0.20 | -0.9 | -0.40 | -0.59 | ||
| 자영업자 | -0.25 | -1.01 | -0.12 | -1.02 | 0.70 | 1.03 | 0.22 | 1.09 | -0.20 | -1.13 | ||
| 무급 가족 종사자 | 0.08 | 0.1 | 0.12 | 0.36 | 0.71 | 1.00 | 1.01 | 0.96 | -0.27 | -0.8 | ||
| 상수 | -0.29 | -0.13 | 1.59 | 1.55 | 1.72 | 1.06 | 0.41 | 0.21 | 2.35 | 2.09* | ||
| N | 96 | 354 | 166 | 97 | 287 | |||||||
| R 제곱 | .2049 | .1189 | .1133 | .1552 | .1296 | |||||||
| F | 1.95*** | 3.59*** | 1.81 | 1.86 | 3.40*** | |||||||
Ⅴ. 결론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직종별로 분석하였다.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에 관해 일대일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500명씩 추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직무적합 이론에 따라 최장기 근로직종과의 기술 및 직무 적합도와 직무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강소랑, 문상호, 2010; 이정의, 2011; 성지영 외, 2017; 허준수 외, 2019; 임승준 외, 2021)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직종별로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문·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 매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일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 및 전문성이 높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생애노동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취업 노인의 직종은 최장기 근로직종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여 고령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최장기 근로직종을 유지할 경우, 전문·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종사 노인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층의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퇴직 전문인력을 세분화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고령자 지원정책 중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중소, 중견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과 함께 사업체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신입사원 교육 및 관리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비록 계속고용 장려금은 주된 일자리의 급여 수준에 이르진 못하지만, 아직 정년연장에 여러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나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최소 근속기간 2년 이상 등)을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 및 업무상 편의(짧은 근무시간)를 고려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장기 근로직종이 현 직종과 일치하더라도, 전문·관리·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직종에서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종에 따라 퇴직 후 같은 직종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각 개인에 맞는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개인 특성별 희망 직종을 파악하여 직업별 훈련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 변수를 응답자의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는 여러 일자리를 종사한 근로자의 노동궤적은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시계열이 관측된 패널분석을 통해 최장기 근로직종에 대한 변수를 여러 시점에 걸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기 직종은 임시직이 많아 응답자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취업 노인의 고용상태를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후속연구에 맡기도록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최초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직종별 직무만족도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를 메울 대안으로 상당수 증가하는 고학력, 고숙련 노인 세대의 생산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이철희, 2024), 노인 세대가 생애 축적한 기술 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2024a).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4. 7. 1. 검색.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list_no=431979&act=view&mainXml=Y
. (2024b).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2024. 5. 1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8031S&conn_path=I2
. (2024c).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직업별 취업분포(7차)]. 2024. 5. 1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8063&conn_path=I2
. (2021). 코로나19 상황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높아 [보도자료]. https://kordi.or.kr/m/content.do?bid=255&mode=view&page=4&cid=397294&cmsId=168
(2004).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ondition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among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car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 65-73. [PubMed]
, & (2012). Job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1), 341-367. [PubMed]
(1984). Measuring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s in organized settings. Medical Care, 22(1), 56-68. [PubMed]
(2018). The Study of Human Development. Routledge. An observatory for life courses: Populations, countries, institutions, and history, pp. 40-4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06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3-1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4-21

- 114Download
- 209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