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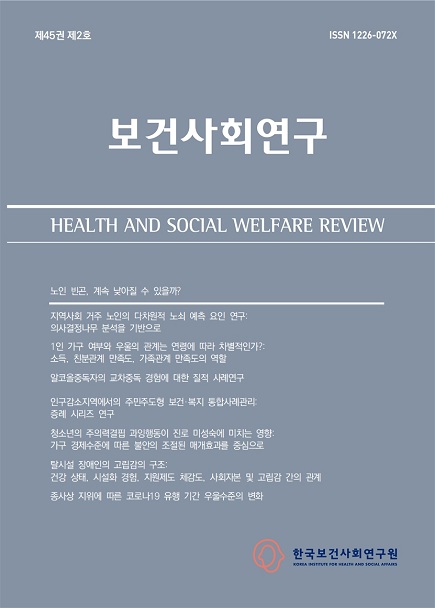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Hierarchy of Impairment and Labor Market Vulnerability in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Focus on the Impact of the Double Count Policy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Kang, Euiyoung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208-236,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208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형 제도)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증가도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 분석 결과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양적으로는 증가시켰으나,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 개선 효과는 가져오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정신적(발달, 정신) 장애인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양적 증대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중증장애인, 특히 신체내부 및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직무적합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Double Count Policy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ntroduced in South Korea. Using the first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d triple differences (DDD) methods to examine the policy’s effects.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the policy increased overall employment among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unexpectedly decreased their likelihood of securing permanent employment and failed to genera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wages and occupational status. In our analysis by disability type, severely disabled workers with sensory impairments and internal disabilities showed lower employmen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ith external physical disabilities, while workers with mental disabilitie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e lowest performance across all indica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policy contributed to quantitative employment growth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improved neither employment stability nor job quality to any significant extent. Furthermore, the policy's varying impact across disability types indicates that it has inadvertently reproduced existing hierarchies of impairment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examining the policy's effects using individual-level data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and suggesting additional policy measures.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장애인 고용에 미친 영향을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자료를 통해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중증 신체외부 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 장애인과 신체내부 장애인의 고용 성과가 더 낮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양적 고용 증가에 기여했으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그 영향 역시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손상의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특히 중증의 신체내부·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직무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Ⅰ.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연구질문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의무고용제 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이 가져온 영향을 분석하며,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손상의 위계 (hierarchy of impairment)(Harpur, 2019)로 인한 노동취약성을 해소하지는 못했음을 드러낸다.
1991년 장애인고용법의 시행 이후 장애의무고용제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은 장애로 인한 차별의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때 시행된 제도들은 많은 경우 고용 자체나 임금을 비롯한 직접적인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평가되어 왔으며, 본 연구가 집중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역시 중증장애인 고용의 증가(정우근, 고제훈, 2014; 왕태규, 한승훈, 2020), 경증장애인과의 비대체성, 중증장애인 고용의 유지(왕태규, 한승훈, 2020)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평가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이들의 노동권 실현과 사회적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생산 중심 노동 개념을 넘어서, 노동은 개인의 자율성과 관계망 형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권리의 장으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권의 실질적 확대로 이해될 여지를 가진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동시에 다소간 장애차별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도 한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손상의 경중을 판단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에서 판단된 손상의 위계를 산술적으로 환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할당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명목적으로 채용하거나 국가 통계에서 중증장애 인을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장애인 고용률을 부풀리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윤현민, 2023). 2010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 이후 전체 장애인 고용자 수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 또한 2009년 25.4%에서 2015년 28.0%(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제도가 고용의 양적 증대를 유인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예컨대 고용형태나 직무 수준—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영향을 직접적 노동 성과만이 아니라 직종, 고용형태, 영향을 받은 장애유형 등 노동취약성과 관련된 지표들과 관련해 살필 필요가 발생한다. 해당 정책이 그 기획에서 내재적으로 손상의 위계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효과의 측면에서라도 ‘중증’ 장애의 보유와 관련된 취약성을 해소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한 보완적 정책이 요구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은 2010년 이후 중증장애 노동자의 고용 성과(고용여부,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 때 증가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특성(고용 형태, 직종)은 어떠한가? 셋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의 영향은 장애유형(신체외부, 감각, 신체내부, 정신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Ⅱ. 선행연구
1.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가.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981년 국제연합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이래 많은 국가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이 때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 두 가지를 기본적인 축으로 한다. 전자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후자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들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 채용, 승진, 급여 등 고용의 제반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국은 이러한 큰 흐름 양자를 모두 채택하는데,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는 의무고용을,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강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정책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표 1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법률 및 정책의 주요 확대 시점
| 제정/개정일자 (시행일자) | 내용 | 세부내용 |
|---|---|---|
| 1990.01.13. (1991.01.01.)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고용 의무화, 고용 촉진 기금 설치 |
| 2000.01.12. (2000.0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고용 촉진 기금 확대 |
| 2007.04.10. (2008.0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 |
| 2009.10.09. (2010.01.01.) |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으로 산정 |
| 2013.04.05. (2014.01.01.) |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300인 이상 기업체 기존 2%에서 이후 2.3%로 |
| 2013.04.05. (2010.01.0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300인 이상 기업체 기존 2.3%에서 민간 2.7%, 공공 3.0% |
| 2018.12.31. (2019.01.01.)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 고용률에 따른 차등 지급 |
| 2021.06.08. (2022.01.01.) |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확대 | 중증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감면 확대 |
이와 같이 확대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정책별로, 또 사용한 데이터별로 그 효과는 다소 비일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Bell과 Heimueller (2009)의 연구나 OECD의 장애인 노동 보고서(2010), WHO의 장애인권 보고서(2011), Sargeant 등(2016)의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장애 고용정책이 비효과성을 보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나, Grammenos (2013)는 유럽 비교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 고용 보호법이 있는 국가에서 장애 관련 불평등이 더 적게 나타났음을 드러낸 바 있으며 Kudo (2010)도 유사하게 일본의 장애의무고용제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였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상술한 불일치는 이 연구들이 대부분 국제 데이터를 활용해 질적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지닌 국가들을 양적으로 코딩한 과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비교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 연구를 살필 경우에도 남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장애고용촉진제 연구들이 기술적 효과만을 가늠 하거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간 보고서의 경우), 부담금과 장려금의 고용 촉진 효과를 직접적인 노동시장 성과에만 한정했기에 계층, 장애상태(유형과 중증도), 교육이나 지역 등 사회학이 주된 관심을 두는 변수들은 분석과 해석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가영, 고길곤, 2019; 유은주, 조성한, 2013; 한승훈 외,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경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도의 명시적 목적만을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고용촉진이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제도가 교차되며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유지나 심화와 관련된 비의도적 효과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한편 장애인의 고용 촉진 입법 및 개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한 정책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이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장애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이전 기준 1급과 2급, 장애등급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임태희, 2009: 1)하는 제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장애고용 관련 국가기관의 통계는 중증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장애노동자 2명으로 환산하며, 사업체의 의무고용에 있어서도 중증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체계는 독일의 중증장애인법이 1976년 일본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시스템을 거쳐 한국의 장애고용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심성지, 최유미, 2012).
이와 같은 제도의 효과성은 한국에서 정우근과 고제훈(2014)의 연구, 그리고 왕태규와 한승훈(2020)의 연구 두 차례에 걸쳐 검토되었다. 전자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의무고용 관련 현황을 참고하여 2006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체 데이터 정보가 확보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OLS 분석을 통해 제도시행 여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수와 고용률(2배수 적용 및 미적용 양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렸다. 왕태규와 한승훈의 경우 장애인고용사업체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시행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고용이 경증장애인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한 번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일정기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 연구들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효과를 살핀 드문 연구들로서 제도시행이 직접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각각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측면에서 살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연구를 요하는 한계도 갖는데, 첫째로 정우근과 고제훈(2014)의 연구는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지 않았고, 둘째로 이중차분 모델을 활용한 왕태규와 한승훈(2020)의 연구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처치집단 내의 이질성과 그로 인한 편향을 개선하지 않아 평행성을 최대한 개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연구 모두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특성상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전체 고용 규모나 고용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고용된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고용형태, 임금 등 개인 수준의 노동시장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측면—예컨대 고용 안정성, 직무적합성, 비정규직 비중 등—은 해당 데이터로 충분히 분석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상술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 관심을 계승하면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처치집단 내의 이질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선, 일자리의 질 관련 변수 검토, 개인 수준 노동시장 변수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삼아 다음과 같이 가설1과 2를 설정하였다. 이 때 설정한 가설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할당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명목적으로 채용’(윤현민, 2023)했을 것이라는 장애계의 비판에 기반한다.
-
H1. 2배수 인정제가 시행된 201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의 영향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 인에 비해 경제적 측면의 노동시장 결과가 더 증가했을 것이다.
-
H1a. 2010년 전후, 경증장애인 고용증가량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량이 더 클 것이다.
-
H1b. 2010년 전후, 경증장애인 임금증가량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임금증가량이 더 클 것이다.
-
H2. 2배수 인정제가 시행된 201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의 영향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고용된 일자리의 질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
H2a. 201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경증장애인 고용형태 개선 정도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형태 개선 정도는 더 작을 것이다.
-
H2a. 201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경증장애인 직업지위 개선 정도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지위 개선 정도는 더 작을 것이다.
2. 손상의 위계와 노동취약성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노동시장 내부의 분리를 포착한 연구들(Hum & Simpson, 1996; Hale et al., 1998; Kidd et al., 2000; Berthoud, 2003; Burchardt, 2003; Jenkins & Rigg, 2004; Jones, Latreille, & Sloane, 2006; Maroto & Pettinicchio, 2014)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손상에 위계가 부여되며 특정 손상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한다(Harpur, 2019). 장애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대표적인 공급 측면 설명은 개별 장애인 노동자들의 선호와 능력(인적자본)의 차이가 직종분리와 임금 차를 낳는다는 것이다(Schur, 2002; Wolfe, 1984; Smith & Twomey, 2002; Jones, 2008; Kaye, 2009). 하지만 학력 등 인적자본의 차이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용형태 및 임금 불평등이 존재하며(Bordieri & Drehmer, 1986; 강동욱, 2004; Domzal, 2008; 오욱찬, 2011; Berre, 2023), 장애인 전반 및 특정 장애인에 대한 ‘통계적 차별’을 고려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능력보다는 학벌, 연령 등 개인의 통계적 특성을 생산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Phelps, 1972), 장애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에 관해서는 주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한 통계적 차별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Doyle, 1995). 이 때 장애상태는 중증-경증으로 나눠지는 장애정도(severity)와 신체/인지/정신/내부장애 등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Hale 등(1998)에 따르면 인적 자본의 결여를 고려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경증장애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은 직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감각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에서 저임금 직종 편중과 같은 노동시장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 때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직종 편중 현상은 다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으며(Hum & Simpson, 1996; Wilkins, 2004), 장애유형과 관련해서는 인지 및 정신장애, 중복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저임금 직종에 더 편중되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Hum & Simpson, 1996; Wilkins, 2004; Maroto & Pettinicchio, 2014). 이 때 ‘저임금 직종’은 더 낮은 교육수준과 노동경험, 직업훈련, 인지 및 심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들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장애로 인해 인적자본의 소유가 제한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지 및 정신장애, 중복장애를 지닌 노동자가 하향 고용된다는(over-skilled) 점에서 수요 측면 요인(대표적으로는 통계적 차별)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Maroto & Pettinicchio, 2014).
이러한 통계적 차별 현상을 몇몇 연구들은 “손상의 위계”(Harpur, 2019, p. 12)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한다. 통념과 달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손상의 정체성(impairment identities)”(Shakespeare, 2010)에 의해 특정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Harpur, 2019). 장애차별주의(ableism)는 “특정 범위의 비장애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Harpur, 2012, p. 325)이기에, 비장애성의 이념형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장애인은 여전히 생산성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사람으로 여겨지는 반면 비장애성의 정도가 더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덜 보호받거나 비난받을 사람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비해 조현병을 가진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Perlin, 1994),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리라는 편견에 쉽게 노출된다(Armstrong, 2011). 이와 같은 위계 위에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기에 문화적 위계는 경제적, 사회적 위계로 확장된다(Harpur, 2019).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2022년 말까지 정신장애인을 제15조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의 우선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며, 이는 정신장애인이 제도적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물론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서비스나 활동지원제도 등 주요 복지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정신장애 인에게도 제공되어 왔으나, 법률상 우선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는 상징적·제도적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하향고용률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오욱찬, 김수완, 2021) 등은 손상의 위계가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장애상태에 따른 직종분리와 임금 불평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손상의 위계 개념과 그로 인한 노동취약성 논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삼중차분 분석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이는 Maroto & Pettinicchio(2014), Wilkins(2004), Hum & Simpson(1996) 등의 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신장애와 인지장애가 신체장애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가설 설정의 방향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상이하며, 임금과 고용,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신체외부장애인이 가장 덜 취약한 위치에, 그리고 감각장애, 신체내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취약성이 더 커진다는 국내 연구들의 논의(강동욱, 2004; 남정휘, 2014; 박자경, 2014; 오욱찬, 김수완, 2021 등)에 기반한다.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상술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1차 웨이브 조사의 1차~8차(2008~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 15~64세)의 경제활동 전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패널 조사로, 경제활동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두루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포괄한다. 데이터의 선택 과정에서 선행연구 부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는 개인의 장애 유형, 고용형태, 직종, 임금 등 세부적인 고용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고용 증가 효과를 넘어서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해당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노동자 개인의 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2차 웨이브 데이터도 존재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0년 전후 자료가 축적된 1차 웨이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 변경을 고려하여 2차 웨이브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2. 변수 설정 및 측정
가설의 검증을 위해 두 가지 처치변수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사용 변수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처치변수 |
|---|---|---|
| 고용여부 (1=employed, 2=unemployed) | 성별, 연령, 혼인여부 | 중증 여부 (1=severe, 0=moderate) |
| 고용지위 (1=fulltime, 2=etc.) | ||
| 로그임금 | 교육연한 장애유형, 연도 | 2배수 인정제 시행 여부 (1=2010 and after, 0=before 2010) |
| 직업지위지수 |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성과로 간주할 수 있는 고용여부, 고용 지위, 로그임금, 직업지위지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고용여부와 고용 지위는 이분형 변수로, 고용여부의 경우 조사 시점 고용되어 노동 중인 패널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패널에는 0의 값을 할당하였다. 고용 지위의 경우 조사 시점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패널에는 1의 값을,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0의 값을 할당하였다. 로그임금은 패널 개인 근로소득의 값에 로그를 씌운 것으로 연속적인 값을 가진다. 직업지위지수의 경우 유홍준과 김월화(2006)가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맞추어 산출한 직업지위지수를 활용하였다(부표 1). 이는 대표적 직업들을 대상으로 직업위세를 조사한 뒤,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연결시키고 수입과 교육수준의 대표값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이다(유홍준, 김월화,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는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만 직종 관련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대분류 수준에서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나.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정보로서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연한, 거주지역을 투입하였으며, 장애 관련 변수로 장애유형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차이의 통제를 위해 연도를 투입하였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1의 값을, 남성인 경우 0의 값을 할당하였으며, 혼인은 조사 시점 혼인한 상태인 경우 1의 값을, 이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할당하였다. 또한 교육연한의 경우, 원데이터의 최종학력 값인 무학, 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을 각각 0, 0, 6, 9, 12, 16으로 변환하여 실질적인 교육 년수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대도시권으로 분류하여 1의 값을, 그 외 지역은 0의 값을 할당하였다. 또한 장애 고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일반적 경향을 고려하여 장애유형은 신체 외부 장애(지체, 뇌병변), 감각장애(시각, 청각, 언어), 신체 내부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1)(지적, 자폐성, 정신)의 네 범주로 나누었다.
다. 처치변수
처치변수는 중증장애 여부, 그리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시행 여부로, 전자는 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인구집단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후자는 인정제도가 조사 시점에 시행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중증장애 여부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의 값을,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0의 값을 할당하였다. 2배수 인정제 시행 여부의 경우 해당 제도가 201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2008, 2009년 조사 자료에는 0의 값을, 2010-2015년 조사 자료에는 1의 값을 할당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표본들의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DID (difference-in-differences) 와 DDD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경증장애인과 비교하였으며(DID 처치), 후자의 경우 중증여부와 장애유형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해 경증장애인과 중증 신체외부장애인, 중증 감각장애인, 중증 신체내부 장애인, 중증 정신적 장애인을 비교하였다(DDD 처치).
표 3
매칭 이전 통제/처치집단별 기술통계(nominal)
| 통제 | DID 처치 | DDD 처치 | |||||||||||
|---|---|---|---|---|---|---|---|---|---|---|---|---|---|
| 경증 | 중증 | 중증 신체외부 | 중증 감각 | 중증 신체내부 | 중증 정신적 | ||||||||
| N=25,471 | N=15,265 | N=7,977 | N=2,834 | N=1,641 | N=2,813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성별 | 여(1) | 9,189 | 36.08 | 5,795 | 37.96 | 2,731 | 34.24 | 1,185 | 41.81 | 930 | 56.67 | 1,168 | 41.52 |
| 남(0) | 16,282 | 63.92 | 9,470 | 62.04 | 5,246 | 65.76 | 1,649 | 58.19 | 711 | 43.33 | 1.645 | 41.52 | |
| 계 | 25,471 | 100 | 15,265 | 100 | 7,977 | 100 | 2,834 | 100 | 1,641 | 100 | 2.813 | 100 | |
| 혼인 여부 | 유배우(1) | 13,480 | 52.92 | 7,183 | 47.06 | 4,181 | 52.41 | 1,559 | 55.01 | 941 | 57.34 | 502 | 17.85 |
| 무배우(0) | 6,713 | 26.36 | 8,082 | 52.94 | 3,796 | 47.69 | 1,275 | 44.99 | 700 | 42.66 | 2,311 | 82.15 | |
| 계 | 20,193 | 79.28 | 15,265 | 100 | 7,977 | 100 | 2,834 | 100 | 1,641 | 100 | 2.813 | 10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광역시(1) | 11,645 | 45.72 | 9,706 | 63.58 | 5,022 | 62.96 | 1,643 | 57.97 | 1,148 | 69.96 | 18,93 | 67.29 |
| 이외(0) | 13,826 | 54.28 | 5,559 | 36.42 | 2,955 | 37.04 | 1,191 | 42.03 | 493 | 30.04 | 920 | 32.71 | |
| 계 | 25,471 | 100 | 15,265 | 100 | 7,977 | 100 | 2,834 | 100 | 1,641 | 100 | 2.813 | 100 | |
| 장애 유형 | 신체 외부(1) | 13,749 | 53.98 | 7,977 | 52.26 | - | |||||||
| 감각(2) | 5,738 | 22.52 | 2,834 | 18.57 | |||||||||
| 신체 내부(3) | 706 | 2.78 | 1,641 | 10.75 | |||||||||
| 정신적( 4) | 0 | 0 | 2,813 | 18.43 | |||||||||
| 계 | 20,193 | 79.28 | 15,265 | 100 | |||||||||
| 고용 여부 | 고용(1) | 10,564 | 41.47 | 3,593 | 23.54 | 1,782 | 22.34 | 966 | 34.09 | 320 | 19.50 | 525 | 18.66 |
| 미고용(0) | 9,629 | 37.81 | 11,672 | 76.46 | 6,195 | 77.66 | 1,868 | 65.91 | 1,321 | 80.50 | 2,288 | 81.34 | |
| 계 | 20,193 | 79.28 | 15,265 | 100 | 7,977 | 100 | 2,834 | 100 | 1,641 | 100 | 2.813 | 100 | |
| 고용 지위 | 상용(1) | 7,742 | 30.39 | 898 | 5.89 | 480 | 6.02 | 220 | 7.76 | 89 | 5.42 | 109 | 3.87 |
| 이외(0) | 2,822 | 11.08 | 2,695 | 17.65 | 1,302 | 16.32 | 746 | 26.33 | 231 | 14.07 | 416 | 14.79 | |
| 계 | 10,564 | 41.47 | 3,593 | 23.54 | 1,782 | 22.34 | 966 | 34.09 | 320 | 19.5 | 525 | 18.66 | |
표 4
매칭 이전 통제/처치집단별 기술통계(numerical)
| 통제 | DID 처치 | DDD 처치 | |||||||||||||||||
|---|---|---|---|---|---|---|---|---|---|---|---|---|---|---|---|---|---|---|---|
| 경증 | 중증 | 중증 | 신체외부 | 중증 | 감각 | 중증 | 신체내부 | 중증 | 정신적 | ||||||||||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
| 연령 | 56.58 | 10.33 | 20,193 | 52.57 | 12.35 | 15,265 | 55.98 | 10.34 | 21,726 | 55.80 | 11.32 | 8,572 | 55.19 | 10.84 | 2,347 | 42.95 | 13.17 | 2,813 | |
| 교육 연한 | 8.38 | 4.32 | 8.08 | 4.7 | 8.26 | 4.55 | 7.29 | 5.02 | 8.65 | 4.29 | 8.03 | 4.89 | |||||||
| 로그 임금 | 2.55 | 3.40 | 1.12 | 2.52 | 1.95 | 3.16 | 2.42 | 3.33 | 1.19 | 2.65 | 0.99 | 2.27 | |||||||
| 직업 지위 | 32.89 | 10.19 | 9,835 | 32.42 | 10.45 | 3,364 | 33.49 | 10.09 | 8,264 | 31.95 | 10.35 | 3,919 | 34.94 | 10.88 | 530 | 24.79 | 7.18 | 486 |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고용가능성, 상용근로 가능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그리고 로지스틱(logistic)과OLS 회귀 모형을 활용한 이중차분법(DID), 삼중차분법(DDD)을 수행하였다.
가. 성향점수 매칭
성향점수 매칭은 처치 이전 처치집단과 최대한 유사한 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균형 점수의 일종인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를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체계적 차이로 인한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감소시킨다(Rosenbaum & Rubin, 1983). 성향점수 매칭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neighbor 매칭과 kernel 매칭 두 가지를 수행한 후 매칭 효과를 평가하여 평균편의(Mean bias)와 중위편의(median bias)가 더 안정적으로 작고, Rubin’s B (B)값이 작으며 Rubin’s R (R) 값이 1에 근접할 것을 기준으로 매칭 방법을 택했다. 이 때 평균편의는 매칭 후 모든 공변량들의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의 평균값이며, 중위편의는 매칭 후 모든 공변량들의 표준화된 차이의 중앙값이다. 그리고 Rubin’s B 값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변량의 평균 차이를 표준화한 값으로 25 미만일 때 좋은 매칭 품질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Rubin’s R 값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 비율로 일반적으로 0.5 이상 2 이하인 경우 좋은 매칭 품질인 것으로 간주된다(Rubin, 2001).
또한 이론적으로는 매칭 시 성향점수는 처치 할당(treatment assignment)에 기반하여야 하며 결과변수와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각 결과변수의 분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특히 고용여부와 상용 근로 여부는 이분형 변수로, 임금과 직업지위지수는 연속변수) 결과변수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매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매칭 과정에서 각 결과변수별로 가장 유사한 비교군을 구성할 수 있도록 STATA 프로그램의 성향점수매칭 명령어에서 결과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매칭하는 옵션을 활용하였다. 이 때 결과변수는 고용여부, 상용근로 여부, 로그임금, 직업지위지수 네 가지로 정하였고, 고용여부와 상용근로 여부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값을 로짓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매칭 시 통제변수는 각 결과값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나이, 거주지역, 교육연한, 혼인여부로 설정하였으며, 결과값을 로그임금과 직업지위지수로 두었을 때는 상용근로 여부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매칭별 효과성 지표 값은 아래의 <표 5>과 같으며 네 변수를 결과값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매칭 모두에서 neighbor 매칭의 편의가 안정적으로 작게 나오고, Rubin’s B와 R 값이 작거나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지위지수의 경우 NNM에서는 편의가 더 크게, B와 R은 각각 더 작고 1에 근접하게 나왔는데, 효과성 테스트를 시각화했을 때 NNM에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성향점수가 잘 매칭된 것으로 판단되어 Kernel이 아닌 NNM으로 매칭하였다(부도 1).
표 5
매칭 방법에 따른 매칭 효과 평가 지표
| Outcome | NNM (N=1) | Kernel |
|---|---|---|
| 고용여부 | MeanBias = 1.8 | MeanBias = 2.4 |
| MedBias = 1.2 | MedBias = 1.8 | |
| B=5.4 | B=6.1 | |
| R = 1.07 | R = 1.26 | |
|
|
||
| 상용근로 여부 | MeanBias = 1.5 | MeanBias = 1.8 |
| MedBias = 1.2 | MedBias = 0.8 | |
| B=4.5 | B=5.7 | |
| R = 1.03 | R = 1.27 | |
|
|
||
| 로그임금 | MeanBias = 1.8 | MeanBias = 2.4 |
| MedBias = 1.2 | MedBias = 1.8 | |
| B=5.4 | B=6.1 | |
| R = 1.07 | R = 1.26 | |
|
|
||
| 직업지위지수 | MeanBias = 2.2 | MeanBias = 1.9 |
| MedBias = 2.7 | MedBias = 0.8 | |
| B=5.5 | B=5.9 | |
| R = 1.07 | R = 1.25 | |
나. 이중차분법과 삼중차분법
이렇게 매칭한 4개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과 삼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하여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2) 이중차분법은 1994년 Card와 Krueger의 펜실베니아-뉴저지 간 최저임금 비교 연구를 통해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후 Duflo (2001), Angrist와 Evans (1998), Meyer 등(1995)의 연구 등 경제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정책이 시행된 전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처치집단과 받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종속변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준실험적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순수한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 제도의 효과를 살피므로, 식 (4)에서 Treat_i는 중증장애 보유 여부를, After_t는 정책 시행 여부를 의미한다. 해당수식에서 Treat_i와 After_t의 상호작용항의 계수 β3 이 이중차분 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삼중차분법은 이중차분법을 확장시킨 방법으로, 처치집단 내부의 이질성까지 포착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식 (5)에서 T1_i는 중증장애 보유 여부를, T2_i는 장애유형을, After_t는 제도시행 여부를 의미하며 이 세 항의 상호작용항의 계수인 β7 이 삼중차분 효과를 의미한다.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따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로지스틱(종속변수가 고용여부 또는 상용근로 여부인 경우) 및 OLS (종속변수가 로그임금 또는 직업지위지수인 경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장애유형별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계수를 추정했다.
IV. 연구 결과
1. 이중차분 결과
표 6
이중차분 분석 결과
| (1) 고용가능성 (Logistic) | (2) 상용근로 가능성 (Logistic) | (3) 로그임금 (OLS) | (4) 직업지위 (OLS) | |
|---|---|---|---|---|
| 처치1(ref. 경증) | ||||
|
|
||||
| 중증 | 0.3587*** | 1.5748*** | -0.7105* | 2.8829*** |
| (.0184) | (.1842) | (.1870) | (.1552) | |
|
|
||||
| 2배수 제도시행(t) | 1.1936** | 2.0053*** | -0.3861 | 0.7297 |
| (.0727) | (.2734) | (.4311) | (.8622) | |
|
|
||||
| 상용 여부(ref. 비상용) | ||||
|
|
||||
| 상용 | 3.5637*** | 2.7395*** | ||
| (.2450) | (.1453) | |||
|
|
||||
| 성별(ref. 남) | ||||
|
|
||||
| 여 | 0.4694*** | 1.3003*** | 0.5477 | -1.4082* |
| (.0137) | (.0934) | (.4194) | (.2981) | |
|
|
||||
| 연령 | 0.9657*** | 0.9527*** | -0.0336 | -0.0793 |
| (.0013) | (.0032) | (.0123) | (.0784) | |
|
|
||||
| 혼인여부(ref. 무배우) | ||||
|
|
||||
| 유배우 | 2.2661*** | 1.1567* | -0.4925 | 2.2629*** |
| (.0672) | (.0095) | (.4314) | (.1376) | |
|
|
||||
| 거주지역(ref. 비수도권 비광역시) | ||||
|
|
||||
| 수도권/광역시 | 0.4723*** | 0.9801 | 0.6999 | -0.7374 |
| (.0130) | (.0588) | (.2493) | (.6570) | |
|
|
||||
| 교육연한 | 1.0207*** | 1.1567*** | 0.0202 | 0.4411* |
| (.0033) | (.0095) | (.0114) | (.0955) | |
|
|
||||
| 장애유형(ref. 신체외부) | ||||
|
|
||||
| 감각 | 1.9590*** | 1.0359 | 0.3873* | -0.9986** |
| (.0631) | (.0697) | (.0697) | (.1238) | |
|
|
||||
| 신체 내부 | 1.0666 | 0.7583* | -0.7268** | 0.3442 |
| (.0583) | (.1017) | (.1098) | (.1601) | |
|
|
||||
| 정신적 | 0.7802*** | 0.4143*** | 0.0194 | -8.8990*** |
| (.0461) | (.0561) | (.2146) | (.6791) | |
|
|
||||
| 중증*t | 1.1983*** | 0.5951*** | 0.7423 | -1.6158 |
| (.0710) | (.0799) | (.2930) | (.8796) | |
|
|
||||
| 연도 | ||||
|
|
||||
| 2009 | 1.0943 | 0.8561 | 0.1658*** | -0.0143 |
| (.0535) | (.0985) | (.0142) | (.0954) | |
|
|
||||
| 2010 | 0.8462** | 0.6577*** | -0.0513 | 0.5527 |
| (.0471) | (.0772) | (.1334) | (1.0877) | |
|
|
||||
| 2011 | 0.9315 | 0.6824*** | -0.1342 | 1.4046* |
| (.0527) | (.0804) | (.1000) | (.3856) | |
|
|
||||
| 2012 | 0.9466 | 0.7835* | 0.0194 | 1.0347 |
| (.0538) | (.0934) | (.1904) | (1.2562) | |
|
|
||||
| 2013 | 0.9258 | 0.7783* | 0.2045 | -0.1574 |
| (.0527) | (.0921) | (.1662) | (.8767) | |
|
|
||||
| 2014 | 0.9172 | 0.6966** | 0.1216 | 0.4115 |
| (.0537) | (.0856) | (.0579) | (.5210) | |
|
|
||||
| 2015 | (omitted) | (omitted) | (omitted) | (omitted) |
|
|
||||
| Cons. | 4.1662 *** | 0.6123* | 4.9362 | 30.3143 |
| (.3655) | (.1294) | (.3352) | (5.3035) | |
|
|
||||
| N | 30,530 | 7,186 | 10,004 | 6,096 |
|
|
||||
| R2 | 0.1108 | 0.1357 | 0.3023 | 0.1522 |
가. 고용가능성
먼저 이분형 변수인 고용여부에 대해 t와 중증장애 보유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넣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 오즈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연한이 높은 경우, 혼인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 오즈가 근소하게 높았다. 장애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신체외부장애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는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먼저 제도시행과 무관하게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을 살폈을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중증도와 무관하게 제도시행 여부만을 살폈을 때, 제도시행 이전 시점에 비해 이후 시점에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중차분 효과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해당 항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데, 2배수 제도시행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드러낸다.
나. 상용근로 가능성
마찬가지로 이분형 변수인 상용근로 여부에 대해 t와 중증장애 보유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넣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 오즈가 근소하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인 경우, 혼인한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용근로 오즈가 높았다. 장애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상용근로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신체외부장애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상용근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는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우선 제도시행과 무관하게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을 살폈을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용근로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다수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계약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많은 상황(김원호 외, 2016; 2022)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 중증도와 무관하게 2배수 제도시행 여부만을 살폈을 때, 제도시행 이전 시점에 비해 이후 시점에 장애인의 상용근로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중차분 효과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해당 항이 상용근로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데, 2배수 제도시행의 상용근로자 창출 효과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에서 감소함을 드러낸다.
다. 로그임금
연속형 변수인 로그임금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 중 상용근로와 장애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상용근로를 하는 경우 비상용근로를 하는 경우에 비해 로그임금이 약 365.37%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로그임금이 약 38.73배 높고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경우 약 72.6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시행 여부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증장애 보유 여부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과 무관하게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을 살폈을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로그임금이 약 71.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 효과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2배수 인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와 경증장애인에 미친 임금 상승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음을 드러낸다.
라. 직업지위
마찬가지로 연속형 변수인 직업지위지수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 중 상용근로를 하는 경우, 혼인을 한 경우, 교육연한이 긴 경우 직업지위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약 99.86% 직업지위지수가 낮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약 889.9%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간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도시행 여부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증장애 보유 여부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도시행과 무관하게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을 살폈을 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직업지위지수가 약 288.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 효과인 중증장애 보유 여부와 제도시행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2배수 인정 제도가 중증 장애인와 경증장애인에 미친 직업지위 상승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음을 드러낸다.
상술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지만, 상용근로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임금과 직업지위지수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가설1과 2가 부분적으로(임금과 직업지위지수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요컨대 제도시행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지만,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낮추고 상용근로 가능성과 직업지위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는 개선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삼중차분 결과
표 7
삼중차분 분석 결과
| (5) 고용가능성 (Logistic) | (6) 상용근로 가능성 (Logistic) | (7) 로그임금 (OLS) | (8) 직업지위 (OLS) | |
|---|---|---|---|---|
| 처치1(ref. 경증) | ||||
|
|
||||
| 중증 | 0.3163*** | 1.7481*** | -0.8876** | 2.9432*** |
| (.0211) | (.2680) | (.0794) | (.2286) | |
|
|
||||
| 2배수 제도시행(t) | 0.9966 | 2.2654*** | -0.0716 | 0.5830 |
| (.0658) | (.3495) | (.1242) | (1.0476) | |
|
|
||||
| 상용여부(ref. 비상용) | ||||
|
|
||||
| 상용 | 3.5466*** | 2.7668*** | ||
| (.2487) | (.1432) | |||
|
|
||||
| 성별(ref. 남) | ||||
|
|
||||
| 여 | 0.4613*** | 1.2950 | 0.5383 | -1.4731* |
| (.0136) | (.0932) | (.4164) | (.2930) | |
|
|
||||
| 연령 | 0.9658*** | 0.9532*** | -0.0325 | -0.0757 |
| (.0013) | (.0032) | (.0127) | (.0807) | |
|
|
||||
| 혼인여부(ref. 무배우) | ||||
|
|
||||
| 유배우 | 2.2287*** | 1.1346*** | -0.5041 | 2.2121*** |
| (.0664) | (.0810) | (.4409) | (.1567) | |
|
|
||||
| 거주지역(ref. 비수도권 비광역시) | ||||
|
|
||||
| 수도권/광역시 | 0.4724*** | 0.9733 *** | 0.7365 | -0.6656 |
| (.0130) | (.0587) | (.2366) | (.7016) | |
|
|
||||
| 교육연한 | 1.0222*** | 1.1552 | 0.0205 | 0.4487* |
| (.0033) | (.0096) | (0.0095) | (.1059) | |
|
|
||||
| 장애유형(ref. 신체외부) | ||||
|
|
||||
| 감각 | 1.5320*** | 1.4223* | 0.8476*** | -2.5208***v |
| (.1123) | (.2444) | (.0404) | (.1256) | |
|
|
||||
| 신체 내부 | 0.4254*** | 0.3285 | -1.2562** | 2.3439* |
| (.0637) | (.2066) | (.1543) | (.5383) | |
|
|
||||
| 정신적 | 0.7336* | 0.3780*** | 0.4304 * | -9.3849** |
| (.0840) | (.1013) | (.1211) | (1.0670) | |
|
|
||||
| 중증 # t | 1.5048 *** | 0.5162*** | 0.6034*** | -2.6854*** |
| (.1179) | (.0916) | (.0246) | (.0590) | |
|
|
||||
| 중증 # (유형) | ||||
|
|
||||
| 감각 | 1.4786*** | 0.5851* | 0.0105 | 0.2525 |
| (.1791) | (.1517) | (.0978) | (.1506) | |
|
|
||||
| 신체 내부 | 2.2894*** | 4.0496* | 1.7317*** | -2.4506* |
| (.4630) | (2.7720) | (.1233) | (.5349) | |
|
|
||||
| 정신적 | (omitted) | (omitted) | (omitted) | (omitted) |
|
|
||||
| (유형) # t (ref. 신체외부) | ||||
|
|
||||
| 감각 | 1.4540*** | 0.7034 | -0.9186*** | 0.8449* |
| (.1277) | (.1412) | (.0264) | (.1591) | |
|
|
||||
| 신체내부 | 7.9782*** | 0.3116 | -0.1670 * | -4.0211** |
| (1.5688) | (.3189) | (.0506) | (.4053) | |
|
|
||||
| 정신적 | 1.0520 | 1.1281 | -0.2973 ** | 1.2606*** |
| (.1382) | (.3425) | (.0280) | (.0956) | |
|
|
||||
| 중증 # (유형) # t (ref. 신체외부) | ||||
|
|
||||
| 감각 | 0.5541*** | 1.7286 | 0.7754*** | 2.4901** |
| (.0796) | (.5252) | (.0408) | (.2342) | |
|
|
||||
| 신체내부 | 0.1167*** | 1.8912 | -0.5862 ** | 5.3995*** |
| (.0295) | (1.9194) | (.0525) | (.3062) | |
|
|
||||
| 정신적 | (omitted) | (omitted) | (omitted) | (omitted) |
|
|
||||
| 연도 | ||||
|
|
||||
| 2009 | 1.0931 | 0.8604 | 0.1426** | -0.0281 |
| (.0535) | (.0995) | (.0204) | (.1076) | |
|
|
||||
| 2010 | 0.8438** | 0.6645*** | -0.0881 | 0.5730 |
| (.0471) | (.0781) | (.1265) | (1.0797) | |
|
|
||||
| 2011 | 0.9360 | 0.6809*** | -0.1689 | 1.3621* |
| (.0531) | (.0803) | (.0970) | (.3686) | |
|
|
||||
| 2012 | 0.9502 | 0.7844* | -0.0213 | 1.0091 |
| (.0543) | (.0937) | (.1715) | (1.1295) | |
|
|
||||
| 2013 | 0.9263 | 0.7798* | 0.1628 | -0.1918 |
| (.0529) | (.0924) | (.1759) | (.8596) | |
|
|
||||
| 2014 | 0.9132 | 0.6944** | 0.0930 | 0.4134 |
| (.0537) | (.0854) | (.0509) | (.5047) | |
|
|
||||
| 2015 | (omitted) | (omitted) | (omitted) | (omitted) |
|
|
||||
| Cons. | 4.6604*** | 0.5613** | 4.7650*** | 30.4965 |
| (.4260) | (.1246) | (.3303) | (5.0150) | |
|
|
||||
| N | 30,530 | 7,186 | 10,004 | 6,096 |
|
|
||||
| R2 | 0.1277 | 0.1390 | 0.3023 | 0.1569 |
가. 고용가능성
삼중차분 분석에서는 중증장애 보유 여부, 시점 변수 그리고 장애유형(4유형)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삼중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먼저 통제변수 중 혼인여부, 고용연한이 고용가능 성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장애유형 변수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고,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 대비 고용가능성이 작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도 신체외부장애인 대비 고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배수 제도시행과 중증장애 보유 여부 중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증장애를 보유한 경우 경증장애인 대비 고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배수 제도시행 이후 중증장애인의 고용 오즈비 상승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삼중 상호작용 항에서 기준 집단(제도시행 이전 경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감각장애인과 신체내부 장애인에서 고용 오즈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에 경증 정신장애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다수의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며, 등록이 된 장애인은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강의영, 2022).
관련하여 중증장애 유형별 고용여부를 95% 신뢰구간과 함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장애인이 시점에 상관없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우상향하는 반면 후자는 우하향하고 있어 제도시행 전후에 중증 감각장애인이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고용여부에서 부적인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증 신체내부 장애인의 경우 제도시행 전후로 고용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좁았다. 삼중 상호작용항 분석에서는 생략된 중증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덜 고용되어 있었지만 증가폭은 유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상용근로 가능성
삼중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용근로 여부에 대해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먼저 통제변수 중 혼인여부가 상용근로 가능성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과 거주지역은 근소하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장애유형 변수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상용근로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 대비 상용근로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배수 제도시행과 중증장애 보유 여부 중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증장애를 보유한 경우 경증장애인 대비 상용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삼중 상호작용항 분석 결과는 모든 집단이 기준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상용근로 가능성의 변화폭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로그임금
삼중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로그임금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용근로를 할 경우 로그임금이 약 354.66%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유형 변수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로그임금이 약 84.76% 높고, 신체내부장애를 가진 경우는 약 125.62% 낮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약 43.04%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배수 제도시행과 중증장애 보유 여부 중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증장애를 보유한 경우 경증장애인 대비 로그임금이 약 84.7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배수 제도시행 이후 중증장애인의 로그임금 변화는 고용 오즈비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삼중 상호작용항은 기준 집단에 비해 감각장애인에서는 로그임금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며, 신체내부 장애인에서는 감소시킨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신적 장애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관련하여 중증장애 유형별 로그임금을 95% 신뢰구간과 함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장애인이 시점에 상관없이 로그임금이 더 높기는 하지만, 전자는 우상향하는 반면 후자는 우하향하고 있어 제도시행 전후에 중증 감각장애인이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임금과 관련하여 부적인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증 신체내부 장애인의 경우도 우하향 변화를 보여주어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제도시행 전후로 부적인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생략된 중증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중증 신체외부장애인과 유사한 임금 증가를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직업지위
마지막으로 삼중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직업지위지수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용근로를 할 경우 직업지위지수가 약 276.68% 높아지고, 혼인을 한 경우 약 221.2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인 경우 직업지위지수가 약 147.31% 낮아졌다. 장애유형 변수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직업 지위지수가 약 252.08% 낮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무려 약 938.49%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배수 제도시행과 중증장애 보유 여부 중 중증장애 보유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증장 애를 보유한 경우 경증장애인 대비 직업지위지수가 약 294.3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배수 제도시행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지위지수 변화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삼중 상호작용항은 기준 집단(제도시행 이전 경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감각장애인과 신체내부 장애인의 직업지위지수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장애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관련하여 중증장애 유형별 고용여부를 95% 신뢰구간과 함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장애인이 시점에 상관없이 더 적게 고용되어 있지만, 전자는 우하향하는 반면 후자는 우상향하고 있어 제도시행 전후에 중증 감각 장애인이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임금과 관련하여 정적인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중증 신체내부 장애인의 경우도 우하향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변화폭은 중증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작아 제도시행 전후로 상대적으로 부적인 경험을 덜 했음을 알 수 있다. 생략된 중증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변화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지위지수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상술한 삼중차분 분석 결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고용가능성, 로그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중증장애인 중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감각, 신체내부 장애인이 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함을 드러낸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른 한국사회 내 노동취약성 논의와 부합하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유형에 의한 노동취약성이 정책 효과의 전달과 발현 측면에서도 재생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직업지위지수와 관련하여서는 중증장애인 중 감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결과로, 그 원인은 단일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직업지위지수가 고용형태나 임금보다 직무적합성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각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장애유형이 직무 배치나 작업환경과의 조응에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해석은 추가적인 질적 연구나 맥락적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가설3은 고용가능성, 로그임금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수용되지만, 4개 중 3개의 종속변수에서 장애 유형별로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촉진 인센티브제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정책구상 시 유형에 따른 필요를 긴밀히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2배수 시행제가 명목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만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관련 경제지표 및 일자리 질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증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유형별로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 셋에 대해 이중차분법과 삼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2배수 인정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상용근로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낳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용가능성, 로그임금, 직업지위와 관련하여 모든 중증장애인이 유사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중증 신체외부 장애인에 비해 감각, 신체내부 장애인이 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고용가능성과 로그임금의 경우), 감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직업지위의 경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분석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중증 신체외부 장애인과 유사한 변화폭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2배수 인정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유효했음을 드러낸다. 중증장애 노동자 1명을 ‘일반’ 장애인 2명으로 간주하는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기업들의 명목적인, 즉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간 격차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생산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시장 결과인 고용가능성은 증대되었지만, 안정적 노동과 관련된 상용근로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직무적합성 및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직업지위지수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술한 비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상의 논의는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남긴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선 2배수 인정제 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질 관련 지표를 의무고용률 산정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가적 시도가 필요하다. 2배수 인정제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점에서 1명을 2명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적 환산이 결과적으로도 양적인 고용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한 지표를 적용하여 지금의 2배수 인정제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고용의 양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페널티적 접근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불안정하고 직무에 맞지 않는, 또한 지위가 낮은 일자리의 양적 증대는 장애인 이외의 다른 소수자의 일자리, 또는 노동시장 전반의 취약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남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조적으로는 최근 한국 사회 노동시장 전반의 분절화나 불안정 노동의 확대 현상과 맞닿아 있다.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자체의 증가가 반드시 노동의 안정성이나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Kalleberg, 2009), 오히려 취약 계층 대상의 고용확대 정책은 저임금이나 불안정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통해 일부 확인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축소, 그리고 기존 위계의 강화(장애유형과 관련하여)는, 취약계층의 삶 자체보다는 노동 성과 지표를 우선시 하는 정책이 기존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결과로 인한 평행성 개선, 그리고 변수의 생략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차분법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집단의 종속변수 추이가 평행해야 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4번의 매칭 중 고용여부 변수와 관련하여 매칭 이전에 비해 이후에 평행성이 더 악화되었다(부도 2). 이는 집단 간 편향은 개선되었으나 차분법의 조건은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후에 다른 매칭 방법을 활용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시기 내 유사한 타겟을 대상으로 도입된 다른 정책들의 효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해당 제도들 역시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다소 복합적인 정책효과를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중요한 한계 중 하나이며, 향후에는 다양한 장애인고용 정책 간 상호작용을 식별하는 분석설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삼중차분 분석의 삼중 상호작용항에서 정신적 장애 변수가 제외되었는데, 경증 정신적 장애인 데이터의 보완이나 장애유형 분류 변경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증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매우 적어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 후자의 경우 장애유형 분류를 변경할 때 참고할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대부분의 연구는 정신적-신체적, 정신적-신체내부-감각-신체외부 두 분류 중 하나를 택하기에 어느 쪽을 택하든 정신적 장애 변수가 삭제될 것이라는 점에서)에서 두 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기에 다른 방식을 고민하여 변수 삭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Notes
여기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정신질환 기인)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장애인고용패널의 장애유형 분류에 기반하여 본 연 구에서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신장애는 2000년대부터 장애 등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낮아 데이터에서 대표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2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전까지는 정신장애가 복지서비스의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제 도상 포함 여부와 실제 데이터상 관측 가능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본 연구는 해당 시기(2008–2015) 동안 장애인고용패널에 포함된 정신장애 표본을 배제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References
. (2016).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데이터 세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edi.kead.or.kr/BoardType17.do?bid=18&mid=37
, & (2008).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the UK: Helping or hindering employment among the disable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8, 465-480. [PubMed]
(2009). Stuck at the bottom rung: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9(2), 115-128. [PubMed]
, , & (2000). Disability and the labour market: An analysis of British mal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6), 961-981. [PubMed]
, & (2005). Has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losed the employment gap?.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7(20), 1261-1266. [PubMed]
(1984). Measuring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2), 187-193. [PubMed]
부록
부표 1.
직업지위지수
| 직업코드 | 직업지위지수 | 직업코드 | 직업지위지수 | 직업코드 | 직업지위지수 |
|---|---|---|---|---|---|
| 11 | 49.72 | 316 | 42.13 | 828 | 40.19 |
| 22 | 98.05 | 317 | 44.47 | 829 | 42.13 |
| 23 | 82.7 | 318 | 44.07 | 831 | 31.75 |
| 24 | 79.62 | 321 | 44.07 | 832 | 29.52 |
| 30 | 73.97 | 322 | 36.71 | 833 | 30.01 |
| 120 | 59.93 | 323 | 33.4 | 841 | 59.99 |
| 131 | 62.55 | 411 | 30.01 | 842 | 44.07 |
| 132 | 56.34 | 412 | 31.95 | 843 | 46.01 |
| 134 | 44.87 | 415 | 36.31 | 844 | 40.19 |
| 135 | 78.65 | 416 | 27.95 | 912 | 29.52 |
| 141 | 99.99 | 421 | 34.37 | 913 | 35.34 |
| 142 | 68.95 | 422 | 32.43 | 914 | 2.87 |
| 143 | 44.87 | 441 | 54.57 | 915 | 15.71 |
| 144 | 54.57 | 442 | 73.17 | 920 | 0.74 |
| 145 | 52.63 | 444 | 40.19 | 930 | 28.17 |
| 151 | 88.7 | 511 | 42.13 | 941 | 19.59 |
| 152 | 59.25 | 512 | 36.31 | 942 | 32.92 |
| 153 | 53.43 | 513 | 32.43 | ||
| 154 | 42.93 | 521 | 34.96 | ||
| 155 | 68.95 | 522 | 29.35 | ||
| 157 | 63.13 | 530 | 36.31 | ||
| 164 | 76.71 | 613 | 36.31 | ||
| 165 | 51.01 | 615 | 42.87 | ||
| 171 | 72.83 | 620 | 28.32 | ||
| 172 | 59.25 | 630 | 21.53 | ||
| 173 | 62.08 | 711 | 46.01 | ||
| 181 | 55.37 | 712 | 42.13 | ||
| 182 | 62.16 | 713 | 42.13 | ||
| 183 | 54.57 | 714 | 46.01 | ||
| 184 | 59.25 | 721 | 46.01 | ||
| 212 | 76.71 | 722 | 37.28 | ||
| 231 | 60.39 | 731 | 36.31 | ||
| 232 | 40.99 | 732 | 38.25 | ||
| 234 | 56.51 | 733 | 46.01 | ||
| 235 | 57 | 741 | 46.98 | ||
| 237 | 46.01 | 742 | 42.13 | ||
| 241 | 28.07 | 743 | 36.9 | ||
| 242 | 42.93 | 744 | 36.31 | ||
| 251 | 53.43 | 751 | 35.34 | ||
| 252 | 51.98 | 752 | 42.13 | ||
| 253 | 52.23 | 753 | 26.01 | ||
| 261 | 63.13 | 754 | 19.59 | ||
| 262 | 49.72 | 811 | 62.89 | ||
| 263 | 56.7 | 812 | 46.01 | ||
| 271 | 62.33 | 813 | 39.22 | ||
| 272 | 43.73 | 814 | 40.19 | ||
| 281 | 29.52 | 815 | 38.25 | ||
| 282 | 40.99 | 816 | 38.25 | ||
| 291 | 82.53 | 817 | 31.95 | ||
| 292 | 47.61 | 821 | 40.19 | ||
| 293 | 60.39 | 822 | 51.83 | ||
| 312 | 42.13 | 823 | 36.31 | ||
| 314 | 48.75 | 825 | 45.04 | ||
| 315 | 36.31 | 826 | 34.37 |
출처: “2005년 한국직업지위지수”, 유홍준, 김월화, 2006.
부도 1
NNM 매칭에 대한 pstest 결과, 성향점수 분포
| Outcome | pstest 결과 | 성향점수 분포 |
|---|---|---|
| 고용 가능성 |
|
|
| 상용 근로 가능성 |
|
|
| 로그 임금 |
|
|
| 직업 지위 지수 |
|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7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1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4-21

- 837Download
- 1871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