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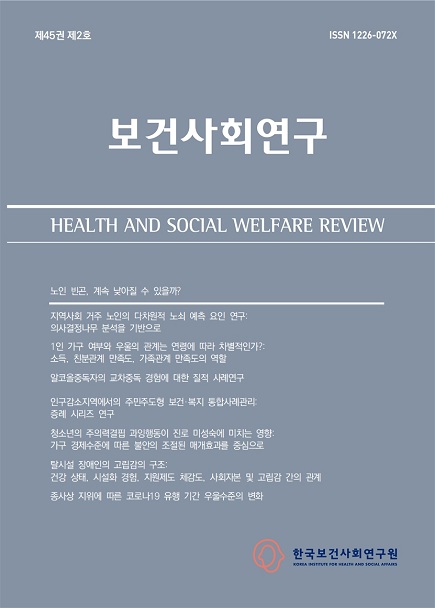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19개국 결합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Effects of Working Hours Distribution on Fertility: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of 19 OECD Countries
Nahm, Jaewook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237-261,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23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노동시간 체제의 전환은 노동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저출산과 재생산 위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여성의 근로시간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는 총근로시간보다는 근로시간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보다는 표준적 근로시간의 단축이 출산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향후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단시간 근로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표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using data from 19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8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Build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fertility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previous studies, we analyzed how the distribution and the duration of working hours affect fertili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ith other factors controlled for, total working hours have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Second,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work less than 40 hours per week has a greater effect on reducing the birth rate than total working hours alone. However, an increase in ultra-short-hour work (fewer than 20 hours per week)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 rate. Thir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both women and men has a similar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Fourth,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t the intermediate level (20 to 40 hours per week) fully mediates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erms of the effect on fertility, policies on working hours should prioritize reducing overall working hours for all worker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time jobs or offering targeted time-support measures for women.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trend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policy, which continues to favors long working hours and supports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the existing 40-hour workweek with a 52-hour cap, may negatively affect fertility.
초록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OECD 19개국의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밝혀온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더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분포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이 각각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총근로시간 자체보다는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도 출산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간 수준의 근로시간 분포(주당 20~40시간)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여성에 대한 별도의 시간지원보다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의 단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지배적이고, 최근 주 40시간(최대 52시간)제도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흐름이 출산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Ⅰ. 문제 제기
개인이나 가정의 자녀 출산 결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 역시 대단히 복합적이며, 한두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수많은 정책을 펼쳐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출산율의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락한 사상 유래 없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통계청, 각 연도).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탐구한다. 근로시간은 노년기에 이르기 전까지 성인의 시간 자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경제활동인구는 물론이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다수가 근로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정을 이룬 경우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정도가 결정되고, 잠재적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규범이 어떤지에 따라 미래의 시간계획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인의 ‘시간’은 자녀출산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자녀출산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공적 아동보육 서비스 및 부모휴가의 중요성 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출산의사결정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비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Gautier, 2007; Baizán, 2009; Begall & Mills, 2011; 송다영, 2014; 최은희, 조택희, 2016; Fukai, 2017; Wood & Neels, 2019; 민규량, 이철희, 2020). 미시적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의 가정 내 분배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들 역시 ‘시간’이라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 문제를 고려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Doepke & Kindermann, 2019; Kleven et al., 2024).
이를 종합하면 근로시간이 출산율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점은 여러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Daido & Tabata, 2013; 송다영, 2024), 여성의 비전형적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Čipin & Međimurec, 2013; Lambert et al., 2024; Wasserman, 2023), 여성의 근로시간이나 시간제 고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Ariza et al., 2005; 원숙연, 이동선, 2012; 민연경, 이명석, 2013; 최은희, 조택희, 2016; 정진화 외, 2019)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거시 수준에서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문제를 다룬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실증적 결과의 이 같은 엇갈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잠재적 해답으로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근로시간의 분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총량으로서의 근로시간은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지 가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존의 실증연구가 대부분 ‘여성’의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 모두를 살펴본다. 개인과 가정의 출산 의사결정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가족 내에서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여성의 근로시간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역시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근로시간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에서 근로시간의 길이와 분포의 영향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은 각각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미시적으로만 다루어지거나 노동시장의 여러 요인 중 한 가지 정도로 다루어졌던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출산율은 매우 복합적인 의사결 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개별적 영향요인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단순히 ‘근로시간 제도를 조정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는 다른 여러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정책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표는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들 중 하나로서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은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및 다른 여러 요인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어느 한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검토1)
1.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은 매우 복합적이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를 탐구해 왔는데 크게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의 핵심은 출산이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발생시키는 비용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Becker(1993)를 위시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는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자녀비용(cost of child)’이라고 하는데 자녀비용이 높을수록 여성은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Mincer, 1962; Butz & Wald, 1979; Becker, 1993; Sleebos, 2003; Adema, 2012).
자녀비용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직접비용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육비용과 주택비용이다. 자녀가 생길 경우 장·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이 교육과 주거이기 때문이다(McDonald, 2000; Sleebos, 2003; Mulder & Billari, 2010; Adema, 2012). 자녀 출산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정의 총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지만(소득효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 혹은 축소를 초래한다(대체효과).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관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가 더 크며,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Spain & Bianchi 1996; Rindfuss 1996; 류덕현, 2007).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주요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오히려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Ahn & Mira, 2002; Engelhardt, & Prskawetz, 2004; Da Rocha & Fuster, 2006; Oshio, 2019). 이는 경력과 자녀출산 사이의 경제적 균형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약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갖는 소득효과의 중요성을 더 높였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관계의 변화에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한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전통적 성역할 인식 약화 등의 변화는 여성에게 자녀출산을 위해 경력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 경우 여성이 자녀출산과 경력지속을 결합하기 용이한 환경이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소득 국가들에서 성평등한 환경이나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 지위는 더 높은 출산율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이다(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Abdollahpour et al., 2020). 여성의 지위가 더 높고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여성이 모성과 경력을 결합할 수 있고,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Esping-Andersen, 2002; 민연경, 이명석, 2013).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대체로 전술한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육아수당이나 가족수당, 세금공제 등이 경제적 요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나 부모휴가 등은 부모에게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일터와 사회에서 성평등을 제고하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왔다(Castles, 2003; 이삼식 외, 2005; Gauthier, 2007; Baizán, 2009; Begall & Mills, 2011; Adema, 2012; 은석, 2015; Fukai, 2017; Wood & Neels, 2019; 민규량, 이철희, 2020; 최윤희, 원숙연, 2020).
그러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실제 효과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부모휴가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그 기간, 부모휴가 급여의 수준, 성별 등에 따라 엇갈린 영향을 갖는다 (Castles, 2003; Gautier, 2007; 김사현, 홍경준, 2014; 최영, 김슬기, 2017).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대개 긍정적으로 기능하지만 국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Milligan, 2005; Gautier, 2007). 이는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율에 관한 실증연구 중 일부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국가 수준의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에서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교육비 지출과 주택비용,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 양성평등 문화와 정부의 저출산 정책, 가정의 가사노동 분배와 삶의 만족도 등의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상당부분 확인되었다(민연경, 이명석, 2013; 민연경, 2015; 정진화 외, 2019; 전승봉, 2020; 최윤희, 원숙연, 2020). 이 연구들 중 전승봉(202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합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이 방법이 국가 수준의 자료를 기초하여 출산율에 대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들의 출산율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 특히 여성이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경제적 요소도 작용하지만, 여성의 경력과 생애설계라는 좀 더 본질적인 자기실현의 욕구도 작용한다. 출산에 부과되는 이와 같은 선택의 압력은 어떤 국가에서나 나타나지만 사회환경이나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Esping-Andersen, 2002). 이는 고소득 국가 내에서도 출산율의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는 원인이다. Kleven 등(2024)은 이를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의 문제로 개념화한 바 있다. 이들은 134개국의 자녀출산과 성별격차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에 수반되는 아동 패널티가 성 불평등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정도는 더 발전된 국가에서 좀 더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들에서 성 불평등은 자녀 출산 외에도 여러 요인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출산이 수반하는 여성의 아동 패널티를 조정하는 요인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주로 주목한 것은 정책적·제도적 요인이지만, 가족 안에서 부담의 분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oepke와 Kindermann(2019)은 여성이 자신의 생식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출산의사결정은 주로 여성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데, 여성의 출산의사는 아이를 갖는 데 따른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환경에서 더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볼 때 이는 아동수당과 같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공적 돌봄 제공과 같은 시간 지원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용-시간의 이와 같은 상대적 중요성은 근로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oepke와 Kindermann(2019)은 출산의 부담 분배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결국 성별 역할 배분에 대한 좀 더 성평등한 문화와 인식이 갖는 중요성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 가구 수준에서 나타나는 양육에 대한 역할분담은 개인적 의시결정이지만,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어느 정도 성평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oepke와 Kindermann의 논의를 확대하면 결국 다시 성평등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김영미와 권현지(2024)는 우리나라에서 종전에는 남성에게 적용되던 일 중심의 시장규범이 여성에게 확대된 반면, 여성에게 주로 부과되던 성별화된 가족규범은 남성에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결과적으로 가족 내 성인 구성원의 역할이 여성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Doepke와 Kindermann이 지적한 아동에 대한 혜택과 부담 의 배분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근로시간과 출산율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이 결국 여성이 경력과 가족을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발생하는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의 문제라고 보면, 노동시장 환경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터가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일수록,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하기 용이할수록 출산 결정에 따르는 부담이 감소하고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Adserà, 2004; 유계숙, 2010; 민연경, 2015).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노동시장 요인은 고용의 질이다. 특히 가족을 형성하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환경이 어떠한지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환경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된다(Jimeno & Rodriguez-Palenzuela, 2002; Rovny, 2011; 김유선, 2016; 신윤정, 2020).
근로시간 역시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다. 장시간 노동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는 특히 여성의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자녀 출산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1차적 부담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성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 비전형적이고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출산의도가 낮아진다는 점도 확인된다(Čipin & Međimurec, 2013; Lambert et al., 2024; Wasserman, 2023).
그러나 여성의 근로시간 총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데이터로 검증한 Ariza 등(2015)의 연구에서는 국가에 따라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시간제 근로의 질, 보육정책, 노동시장 환경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노동시간 조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준의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지자체별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동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희, 조택희, 2016).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국가수준의 거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결과는 엇갈린다.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지만(정진화 외, 201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원숙연, 이동선, 2012; 민연경, 이명석, 2013). 다만 이 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총근로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분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출생에 따른 1차적 부담을 지는 것이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남성의 근로시간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특히 고소득 국가들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는 출산율 맥락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Duvander & Andersen, 2006; Duvander & Lappegard, 2020), 앞서 살펴본 가정 내 출산과 육아 부담 분배의 측면에서도 남성의 근로시간은 중요할 것이다. 물론 남성의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남성 육아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장시간 근로상황에 비해 부담의 분배가 용이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자녀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단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실제 영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시장 참여자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표준적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의 주체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아 흔히 1.5인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나 1.5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초단 시간 노동이 갖는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출산율에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한 편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하지만 (Castles, 2003; Sleebos, 2003),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가 엇갈린다(Adserà, 2004; 민연경, 2015; Ogawa et al., 2020). 또한 시간제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방식에 따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Gornick & Heron, 2006).
출산에 관한 복합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결국 개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연성 확보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유연성이 개별 근로자의 생애설계에 유용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의 시간자율성을 얼마나 허용하는지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이다. 그리고 아동 패널티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Doepke & Kindermann, 2019; Kleven, 2024), 특정한 집단에게 근로시간 감소나 유연성이 집중되는 방식보다는 경제활동 참여자 전반의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3.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근로시간 현황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근로시간 추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38개국 중 15개국은 2020년의 출산율이 2000년에 비해 높고 반면, 23개국은 낮다. 2000년에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14명(체코)에서 2.95명(이스라엘)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1.70명을 기록한 반면, 2020년에는 0.84명(한국)에서 2.90명(이스라엘)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1.59명으로 낮아졌다. 2000년에 인구유지 수준인 2.1 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멕시코, 튀르키예의 4개국이었고, 칠레, 아이슬란드, 미국이 2.0명을 넘어 인구유지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0년에 2.1명을 넘어선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며, 2.0명을 넘은 국가 역시 이스라엘과 멕시코뿐이다. 지난 20여 년간 주요 고소득 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로 감소하였고, 특히 2000년에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국가들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표 1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0)
| 국가코드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증감('20-'00) |
|---|---|---|---|---|---|---|
| AUS | 1.76 | 1.85 | 1.95 | 1.79 | 1.58 | ▲0.18 |
| AUT | 1.36 | 1.41 | 1.44 | 1.49 | 1.44 | 0.08 |
| BEL | 1.64 | 1.74 | 1.84 | 1.69 | 1.72 | 0.08 |
| CAN | 1.49 | 1.54 | 1.63 | 1.56 | 1.50 | 0.01 |
| CHE | 1.50 | 1.42 | 1.54 | 1.54 | 1.46 | ▲0.04 |
| CHL | 2.06 | 1.91 | 1.88 | 1.75 | 1.61 | ▲0.45 |
| COL | 2.57 | 2.26 | 1.99 | 1.86 | 1.77 | ▲0.80 |
| CRI | 2.36 | 2.02 | 1.89 | 1.81 | 1.72 | ▲0.64 |
| CZE | 1.14 | 1.28 | 1.49 | 1.57 | 1.71 | 0.57 |
| DEU | 1.38 | 1.34 | 1.39 | 1.50 | 1.53 | 0.15 |
| DNK | 1.77 | 1.80 | 1.87 | 1.71 | 1.67 | ▲0.10 |
| ESP | 1.23 | 1.33 | 1.37 | 1.33 | 1.36 | 0.13 |
| EST | 1.36 | 1.52 | 1.72 | 1.58 | 1.58 | 0.22 |
| FIN | 1.73 | 1.80 | 1.87 | 1.65 | 1.37 | ▲0.36 |
| FRA | 1.87 | 1.92 | 2.02 | 1.93 | 1.79 | ▲0.08 |
| GBR | 1.64 | 1.76 | 1.92 | 1.80 | 1.56 | ▲0.08 |
| GRC | 1.25 | 1.34 | 1.48 | 1.33 | 1.28 | 0.03 |
| HUN | 1.33 | 1.32 | 1.26 | 1.44 | 1.52 | 0.19 |
| IRL | 1.90 | 1.88 | 2.05 | 1.85 | 1.63 | ▲0.27 |
| ISL | 2.08 | 2.05 | 2.20 | 1.81 | 1.72 | ▲0.36 |
| ISR | 2.95 | 2.84 | 3.03 | 3.09 | 2.90 | ▲0.05 |
| ITA | 1.26 | 1.33 | 1.44 | 1.36 | 1.24 | ▲0.02 |
| JPN | 1.36 | 1.26 | 1.39 | 1.45 | 1.33 | ▲0.03 |
| KOR | 1.48 | 1.09 | 1.23 | 1.24 | 0.84 | ▲0.64 |
| LTU | 1.39 | 1.29 | 1.50 | 1.70 | 1.69 | 0.30 |
| LUX | 1.78 | 1.62 | 1.63 | 1.47 | 1.37 | ▲0.41 |
| LVA | 1.25 | 1.39 | 1.36 | 1.70 | 1.74 | 0.49 |
| MEX | 2.72 | 2.50 | 2.34 | 2.22 | 2.08 | ▲0.64 |
| NLD | 1.72 | 1.71 | 1.80 | 1.66 | 1.55 | ▲0.17 |
| NOR | 1.85 | 1.84 | 1.95 | 1.73 | 1.48 | ▲0.37 |
| NZL | 1.98 | 1.97 | 2.17 | 1.99 | 1.61 | ▲0.37 |
| POL | 1.37 | 1.24 | 1.38 | 1.29 | 1.38 | 0.01 |
| PRT | 1.56 | 1.42 | 1.39 | 1.30 | 1.40 | ▲0.16 |
| SVK | 1.29 | 1.25 | 1.40 | 1.40 | 1.53 | 0.24 |
| SVN | 1.26 | 1.26 | 1.57 | 1.57 | 1.60 | 0.34 |
| SWE | 1.55 | 1.77 | 1.98 | 1.85 | 1.66 | 0.11 |
| TUR | 2.27 | 2.12 | 2.08 | 2.15 | 1.76 | ▲0.51 |
| USA | 2.06 | 2.06 | 1.93 | 1.84 | 1.64 | ▲0.42 |
| 평균 | 1.70 | 1.67 | 1.75 | 1.68 | 1.59 | ▲0.11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OECD, 2000-2020, OECD statistics, Fertility rate, 2022. 9. 30. 검색, http://oe.cd/fdb
연간 총근로시간 추이 역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통계가 확인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총 근로시간은 감소되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90시간에 달한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감소 역시 상당하다. 다만 2020년의 근로시간 감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표 2>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21년 이후의 근로시간은 2020년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연간 총 근로시간이 감소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동안 출산율 역시 감소한 샘이다.
표 2
OECD 국가들의 1인당 연간 총 근로시간 추이(2000~2020)
| 국가코드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증감(`20-`00) | 증감(`15-`00) |
|---|---|---|---|---|---|---|---|
| AUS | 1,852 | 1,808 | 1,778 | 1,751 | 1,683 | ▲169 | ▲68 |
| AUT | 1,675 | 1,632 | 1,552 | 1,495 | 1,401 | ▲274 | ▲94 |
| BEL | 1,589 | 1,578 | 1,574 | 1,575 | 1,443 | ▲146 | ▲132 |
| CAN | 1,787 | 1,745 | 1,715 | 1,712 | 1,644 | ▲143 | ▲68 |
| CHE | 1,713 | 1,690 | 1,611 | 1,577 | 1,498 | ▲214 | ▲78 |
| CHL | 2,263 | 2,157 | 2,070 | 1,994 | 1,825 | ▲438 | ▲168 |
| COL | - | - | 2,325 | 1,964 | - | ▲361 | |
| CRI | 2,362 | 2,352 | 2,243 | 2,148 | 1,913 | ▲449 | ▲235 |
| CZE | 1,900 | 1,803 | 1,799 | 1,751 | 1,704 | ▲197 | ▲48 |
| DEU | 1,466 | 1,432 | 1,426 | 1,401 | 1,324 | ▲142 | ▲77 |
| DNK | 1,466 | 1,451 | 1,422 | 1,407 | 1,342 | ▲124 | ▲65 |
| ESP | 1,753 | 1,724 | 1,706 | 1,694 | 1,570 | ▲183 | ▲125 |
| EST | 1,884 | 1,913 | 1,785 | 1,763 | 1,637 | ▲247 | ▲126 |
| FIN | 1,650 | 1,613 | 1,585 | 1,555 | 1,529 | ▲121 | ▲26 |
| FRA | 1,558 | 1,532 | 1,540 | 1,519 | 1,407 | ▲151 | ▲112 |
| GBR | 1,558 | 1,544 | 1,507 | 1,525 | 1,364 | ▲194 | ▲161 |
| GRC | 1,998 | 2,025 | 1,931 | 1,935 | 1,731 | ▲267 | ▲204 |
| HUN | 1,932 | 1,834 | 1,766 | 1,746 | 1,657 | ▲275 | ▲89 |
| IRL | 1,933 | 1,883 | 1,721 | 1,771 | 1,746 | ▲187 | ▲25 |
| ISL | 1,696 | 1,637 | 1,528 | 1,511 | 1,446 | ▲250 | ▲65 |
| ISR | 2,033 | 1,966 | 1,957 | 1,895 | 1,783 | ▲250 | ▲113 |
| ITA | 1,850 | 1,811 | 1,777 | 1,718 | 1,554 | ▲297 | ▲164 |
| JPN | 1,821 | 1,777 | 1,733 | 1,719 | 1,598 | ▲223 | ▲121 |
| KOR | - | - | 2,163 | 2,083 | 1,908 | - | ▲175 |
| LTU | 1,630 | 1,659 | 1,697 | 1,673 | 1,595 | ▲35 | ▲78 |
| LUX | 1,605 | 1,567 | 1,521 | 1,519 | 1,420 | ▲185 | ▲99 |
| LVA | 1,865 | 1,842 | 1,692 | 1,663 | 1,577 | ▲288 | ▲86 |
| MEX | 2,174 | 2,105 | 2,150 | 2,140 | 2,124 | ▲50 | ▲16 |
| NLD | 1,464 | 1,434 | 1,420 | 1,426 | 1,407 | ▲57 | ▲19 |
| NOR | 1,448 | 1,429 | 1,430 | 1,427 | 1,411 | ▲37 | ▲16 |
| NZL | 1,836 | 1,815 | 1,755 | 1,753 | 1,739 | ▲97 | ▲14 |
| POL | 1,858 | 1,856 | 1,829 | 1,829 | 1,769 | ▲90 | ▲60 |
| PRT | 1,770 | 1,750 | 1,746 | 1,732 | 1,611 | ▲159 | ▲121 |
| SVK | 1,816 | 1,769 | 1,805 | 1,754 | 1,572 | ▲244 | ▲182 |
| SVN | 1,710 | 1,697 | 1,680 | 1,687 | 1,534 | ▲176 | ▲153 |
| SWE | 1,486 | 1,451 | 1,483 | 1,466 | 1,426 | ▲59 | ▲40 |
| TUR | 1,937 | 1,936 | 1,877 | 1,811 | 1,572 | ▲365 | ▲238 |
| USA | 1,832 | 1,794 | 1,772 | 1,783 | 1,767 | ▲65 | ▲16 |
| 평균 | 1,783 | 1,750 | 1,723 | 1,717 | 1,610 | ▲190 | ▲106 |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OECD, 2019, OECD statistics, Hours Worked, 2022. 9. 30. 검색, http://oe.cd/65Y; OECD statistics (stats.oecd.org), 최종접속일: 2022-09-30.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참여자를 2019년 기준의 근로시간 분포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당 40시간 이상이 표준적 고용이라는 것이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이들의 비율이 63.2%에 이른다. 근로시간 분포가 파악되는 37개국 중 주당 20~40시간 미만의 비율이 주당 40시간 이상보다 높은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핀란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의 8개국뿐이다. 나머지 29개 국가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 중 27개국은 절반 이상, 19개국은 70% 이상이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 주당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은 0.7%~19.3% 사이에 분포하며, 37개국 평균은 7.2%로 나타난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2019년)
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미국을 제외한 37개국.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OECD, 2019, OECD statistics, Hours Worked, 2022. 09. 30. 검색, http://oe.cd/65Y
일반적으로 총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시간을 낮추는 데는 초단시간 노동을 늘리는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OECD 37개국의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총 근로시간(Y축)과 주당 20시간 미만 노동의 비율(X축)을 각각 표준화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근로시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2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연간 총 근로시간이 길고,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비율도 낮은 국가들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이스라엘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로 남부유럽 혹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위치한다. 이 대척점에는 총근로시간이 짧고 초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자리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유럽 국가들은 물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1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들은 총근로시간이 길면서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다.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총근로시간은 짧지만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도 낮은 국가들은 3사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다.2)
그림 2
OECD 국가들의 표준화된 총근로시간(Y)과 주당 20시간 노동자 비율(X)(2019년)
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미국을 제외한 37개국.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OECD, 2019, OECD statistics, Hours Worked, 2022. 9. 30. 검색, http://oe.cd/65Y
이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의 길이와 분포는 출산율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여기에 제시된 것만으로 이를 제대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인들의 작용을 통제하고 남녀 간 근로시간 분포의 차이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가설 및 변수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에서 근로시간의 길이와 분포,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 현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근로시간의 길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근로시간 분포의 영향,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을 지원한다는 기존 연구의 발견을 넘어서 근로시간 단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때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한다.
-
가설1. 총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
가설2. 출산율에는 근로시간 분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초단시간 근로를 높이는 방향보다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을 지향할 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이다.
-
가설3.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장시간 근로 감소 역시 출산율을 높일 것이다.
-
가설4. 근로시간의 분포는 총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각각의 가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의 단축은 가구들이 출산과 양육에 소모되는 시간자원을 확보하기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시간이 아닌 총근로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이 전반적인 단축과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라는 두 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다고 볼 때,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 단축에서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불안정 고용의 증가, 주로 여성에게 양육부담을 지우는 1.5인 생계부양자 모델로의 전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출산행위가 가정 내 성인 구성원 간의 역할분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연구들이 확인해온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분포를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가설에 기초해서 보면 출산율에 대한 근로시간의 영향을 검증하는 데 성별 총 근로시간보다 성별 근로시간 분포가 더욱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근로시간 분포를 근로시간의 표준편차나 변동계수 등이 아닌 주당 40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 및 20시간 미남 취업자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넷째, 앞선 가설들을 통해 총근로시간의 감소와 근로시간 분포가 관련성이 있는 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근로시간의 단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시간의 분포, 즉 누구의 근로시간이 어떤 식으로 단축되는가를 매개로 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총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분포(40시간 미만 비율, 20시간 미만 비율)가 된다. 가설3의 검증을 위해 근로시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가설4의 검증을 위해 근로시간의 분포(20~40시간 비율)는 매개변수로도 활용될 것이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 즉 현재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 말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숫자이다.
통제변수로는 2장 1절에서 살펴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요인들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우선 경제적 요인으로는 로그 1인당 GDP, 가계 최종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 관련 지출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지수가 투입되며,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여성 한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율을 투입하였다. 성평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와 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를 투입하였다. GII는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단계 이상 교육받은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바탕으로 성별격차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지수다. GDI는 출생 시 기대여명, 평균 교육 연수, 기대 교육 연수, 1인당 GNI를 기반으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DI)의 성비로 측정한다. 정책요인과 관련된 변수로는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율을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투입하였고, 여성의 출산·부모·돌봄유가 일수와 조세혜택을 살펴볼 수 있는 가족관계 비율을 투입 하였다. 만약 본 연구의 목표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변수를 필요로 하겠지만, 이 연구에서 가족정책과 관련된 변수는 통제변수에 해당하기에 포괄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OECD 통계(OECD Statistics)를 활용하였으며, GII와 GDI는 UN개발계획(UNDP)에서 공개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출처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변수의 정의 및 자료
| 구분 | 정의 | 출처 | |
|---|---|---|---|
| 종속변수 | 합계출산율 | OECD | |
| 독립 변수 | 총 근로시간 | 전체 취업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 | OECD |
| 근로시간 분포 | 전체 취업자 대비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남성 취업자 대비 주당 40시간 미만 남성 취업자 비율 여성 취업자 대비 주당 40시간 미만 여성 취업자 비율 |
OECD | |
| 전체 취업자 대비 주당 20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 남성 취업자 대비 주당 20시간 미만 남성 취업자 비율 여성 취업자 대비 주당 20시간 미만 여성 취업자 비율 |
|||
| 통제 변수 | 경제적 요인 | 로그 1인당 GDP(2015년 PPP 불변가격 기준) | OECD |
| 가계 최종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 관련 지출 비율 | OECD | ||
|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지수(2015=100) | OECD | ||
| 청년 고용률 | |||
| 여성 고용률 | |||
| 성별 임금격차(남성 중위임금 대비 여성 중위임금 비율) | |||
| 여성 비정규직(한시적 고용) 비율 | |||
| 사회·문화적 요인 | 성불평등지수(GII) | UNDP | |
| 성개발지수(GDI) | UNDP | ||
| 정책 요인 | GDP 대비 가족정책 현금지출 비중 | OECD | |
| GDP 대비 가족정책 서비스지출 비중 | OECD | ||
| 여성의 출산·부모·가족돌봄 휴가 일수 | OECD | ||
| 가족과세비율 (독신가구 소득세)/(두 자녀 1인생계부양자 가구 소득세) |
OECD | ||
2.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19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2000~2018년 19년간의 시계열자료와 결합하여 구성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을 수행하였다.3) 패널자료를 활용한 결합시계열분석은 사례 간의 변이와 시간에 따른 변이를 모두 관찰할 수 있을뿐 아니라 표본을 횡단 사례수와 종단 사례 수의 곱으로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사례 수를 분석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분석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들이나(Huber et al., 1993; Bonoli & Reber, 2010; 김수완, 백승호, 2011; 이지은, 이영범, 2017), 출산율 관련 연구에서 빈번히 활용되어왔다(민연경, 이명석, 2013; 민연경, 2015; 최윤희, 원숙연, 2020).
분석대상 국가 선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4) 분석기간 역시 우선적으로 모든 변수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기를 고려했으며, 2020년 이후의 근로시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패널은 19개국, 국가별 5~19개 시점의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국가-기간에 대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결합시계열분석은 국가 간 비교분석에 유용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결합시계열 자료를 일반적인 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우 시계열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오차항 간 이분산성(heteroschedasticity), 패널 개체 간 동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 등이 발생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위배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패널교정표준오차모형(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을 적용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Beck & Katz, 1995).
표 4
분석대상 19개국의 변수별 기술통계량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합계출산율(명) | 1.60 | 0.23 | 0.98 | 2.02 |
| 1인당 GDP(USD) | 42,605 | 9,217 | 19,440 | 68,516 |
| 가계 최종소비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 | 1.46 | 1.47 | 0.03 | 7.64 |
|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지수 | 96.94 | 14.10 | 63.18 | 153.76 |
| 청년 고용률(%) | 43.32 | 13.76 | 15.60 | 65.40 |
| 여성 고용률(%) | 52.03 | 7.56 | 30.60 | 68.90 |
| 성별 임금격차(%) | 16.24 | 7.74 | 2.20 | 39.60 |
| 여성 비정규직 비율(%) | 13.00 | 5.49 | 4.10 | 30.20 |
| 성불평등지수(GII) | 0.98 | 0.02 | 0.92 | 1.01 |
| 성개발지수(GDI) | 0.11 | 0.05 | 0.02 | 0.25 |
| GDP 대비 가족정책 현금지출 비중(%) | 1.41 | 0.55 | 0.03 | 2.57 |
| GDP 대비 가족정책 서비스지출 비중(%) | 0.98 | 0.57 | 0.14 | 2.44 |
| 가족과세 비율(배) | 0.75 | 0.11 | 0.40 | 0.90 |
| 여성의 출산·부모·가족돌봄 휴가 일수(일) | 71 | 48 | 0 | 170 |
| 총근로시간(시간/연) | 1,630 | 169 | 1,389 | 2,228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 47.57 | 21.20 | 6.02 | 87.92 |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 8.16 | 4.21 | 0.45 | 15.20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여성)(%) | 60.80 | 22.73 | 8.61 | 93.59 |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여성)(%) | 12.46 | 6.77 | 0.65 | 27.60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남성)(%) | 36.37 | 20.75 | 3.72 | 82.97 |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남성)(%) | 4.54 | 2.52 | 0.16 | 11.17 |
본 연구의 자료 역시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상관의 경우 패널자료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PESE 모형에 자기상관과 동시상관을 고려한 AR(1) 옵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5) 또한 패널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주요 분석모델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였으며, 대부분의 모델에서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6)
Ⅳ. 분석 결과
1. 근로시간의 길이와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가설1, 2)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총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분포(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Model1~3). 특히 근로시간 분포의 경우에는 총근로시간과 함께 투입하여 총근로시간의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된 상태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총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Model1 | Model2 | Model3 |
|---|---|---|---|
| 로그 1인당 gdp | 0.4756(0.0818)*** | 0.2565(0.0709)*** | 0.4491(0.0914)*** |
| 교육비 지출 | 0.0296(0.0118)* | 0.0064(0.0103) | 0.0223(0.014) |
| 주거비 지출 | 0.0004(0.0006) | 0.0009(0.0005) | 0.0004(0.0006) |
| 청년 고용률 | -0.0039(0.0012)** | -0.0045(0.0013)** | -0.0045(0.0012)*** |
| 여성 고용률 | 0.0066(0.0016)*** | 0.012(0.0016)*** | 0.007(0.0017)*** |
| 여성 한시적 고용 | -0.001(0.0019) | 0.0006(0.0017) | -0.0009(0.0019) |
| 성별임금격차 | 0(0.0021) | -0.0009(0.0018) | 0.0002(0.0021) |
| GDI | 4.5814(0.9344)*** | 2.7054(0.7474)*** | 4.4013(0.9046)*** |
| GII | 1.3588(0.4982)*** | 1.6909(0.4383)*** | 1.4215(0.4822)** |
| 가족정책(현금) | 0.1148(0.0216)*** | 0.0956(0.0199)*** | 0.1172(0.0225)*** |
| 가족정책(현물) | 0.1291(0.0295)*** | 0.0828(0.0258)** | 0.1347(0.0283)*** |
| 가족과세비율 | 0.0824(0.0896) | -0.1264(0.0866) | 0.0912(0.0947) |
| 부모휴가 | -0.0010(0.0002)*** | -0.0007(0.0002)*** | -0.0009(0.0002)*** |
| 총근로시간 | -0.0002(0.0001)* | 0.0001(0.0000) | -0.0001(0.0001) |
| 40시간 미만 비율 | 0.0059(0.0007)*** | ||
| 20시간 미만 비율 | 0.0050(0.0049) | ||
| 상수항 | -8.2876(1.4752)*** | -5.0163(1.2305)*** | -7.9867(1.4538)*** |
| N수 | 262 | 262 | 262 |
| Wald chi2 | 2686.76*** | 4322.44*** | 3059.78*** |
통제변수 중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로그 1인당 GDP, 교육비 지출(Model1), 청년고용률, 여성고용률, GDI, GII, 가족정책(현금/현물), 부모휴가 등이 있었다. 유의한 통제변수의 방향은 대체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었지만, 교육비지출(+), 청년고용률(-), 부모휴가(-)는 기존의 이론적 예측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교육비 지출은 Model1에 제한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지출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예측과 상반된다. 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R2=.06), 다변량 모형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되었다. 청년고용률 역시 유사한 경우로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이지만(R2=.16) 다변량 모형에서 음의 결과를 나타냈다. 다변량 모형에서 역방향 관계가 나타난 것에는 교육비 지출은 높지만 출산율이 높은 국가(오스트리아), 교육비 지출이 낮지만 출산율도 낮은 국가(독일), 출산율이 높지만 청년 고용률이 낮은 국가(프랑스, 벨기에), 출산율이 낮지만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변수 간 관계는 이론적 예측대로인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론적 예측과 다른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휴가의 경우 특히 여성에게 제공되는 휴가가 긴 것이 오히려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부담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출산율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휴가가 출산율에 대해서 갖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Castles, 2003; Gautier, 2007; 김사현, 홍경준, 2014; 최영, 김슬기, 2017).
근로시간의 분포가 고려되지 않는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출산율에 그 정도는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총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근로시간은 높아진다(Model1). 그러나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에서 총근로시간의 영향은 사라진다. 반면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1% 높아질 때마다 합계출산율도 0.006만큼 높아진다. 즉, 평균적인 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4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출산율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를 통한 단축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림 2]와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근로 시간, 20~40시간 노동자 비율,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을 각각 표준화하고,7) 총근로시간의 표준점수가 양의 값을 보이는 사례를 ‘장시간 노동’ 유형으로, 총근로시간의 표준점수는 음의 값을 보이면서 20~40시간 노동자 비율의 표준점수는 양의 값을 보이는 사례를 ‘전반적 단시간 노동’ 유형으로, 총근로시간의 표준점수와 20~40시간 노동자 비율은 음의 값을 보이고,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의 표준점수만 양의 값을 보이는 사례를 ‘양극화된 단시간 노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8) 그 결과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사례가 118개, ‘전반적 단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사례가 96개, ‘양극화된 단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사례가 48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분포는 합계출산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표 6>과 <표 7>은 어떤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 우선 단순히 세 가지 유형의 근로시간 배치에 따른 합계출산율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하여 비교하면, 전반적 단시간(1.76), 양극화된 단시간(1.60), 장시간(1.4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합시계열 모형에 근로시간 단축의 유형을 투입한 결과 장시간 노동 유형과 양극화된 단시간 노동 유형 사이의 출산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반적 단시간 노동 유형만이 출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단축하는가?’에 따라 유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보다는 전반적 노동시간 감축이 필요하다.
표 6
근로시간 유형에 따른 합계출산율 차이
| 구분 | 근로시간 유형별 합계출산율 평균(표준편차) | F | Scheffe | ||
|---|---|---|---|---|---|
| 장시간(a) | 전반적 단시간(b) | 양극화된 단시간(c) | |||
| 출산율 | 1.46(0.20) | 1.76(0.15) | 1.60(0.20) | 68.01*** | b>c>a |
표 7
총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Model4 | 구분 | Model4 |
|---|---|---|---|
| 로그 1인당 gdp | 0.4256(0.0862)*** | 가족정책(현금) | 0.0969(0.0217)*** |
| 교육비 지출 | 0.0275(0.0118)* | 가족정책(현물) | 0.1092(0.0261)*** |
| 주거비 지출 | 0.0001(0.0006) | 가족과세비율 | 0.0363(0.0899) |
| 청년 고용률 | -0.0035(0.0013)** | 부모휴가 | -0.001(0.0002)*** |
| 여성 고용률 | 0.0081(0.0015)*** | 총근로시간 | -0.0001(0.0001) |
| 여성 한시적 고용 | -0.001(0.0019) | 근로시간 유형(기준: 장시간) 전반적 단시간 양극화된 단시간 |
0.0703(0.0215)** -0.0245(0.0233) |
| 성별임금격차 | -0.0006(0.002) | ||
| GDI | 4.1598(0.8421)*** | ||
| GII | 1.368(0.4892)** | 상수항 | -7.4199(1.3897)*** |
| N수 | 262 | ||
| N수 | 2777.31*** | ||
2.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차이(가설3)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영향에서 성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주로 여성의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시간부족을 주되게 경험하며, 동시에 출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물론 타당하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 내 협상에 의해 양육자들이 분담하는 상황으로 보면, 남성의 시간 역시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결합시계열 모델의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추정을 지지하고 있다. 우선 주당 40시간 미만 비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Model5)과 남성(Model6) 모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는 여성(0.0072)이 남성(0.004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주당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총근로시간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확인되었다.
요컨대 근로시간의 전반적 단축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에게 적용될 때와 남성에게 적용될 때 모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초단시간 노동 중심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패턴의 형성은 그것이 여성에 대한 것이든 남성에 대한 것이든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8
근로시간 분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성별 구분)
| 구분 | Model5 | Model6 | Model7 | Model8 |
|---|---|---|---|---|
| 로그 1인당 gdp | 0.1465(0.0707)* | 0.3429(0.0769)*** | 0.4585(0.0933)*** | 0.469(0.0831)*** |
| 교육비 지출 | 0.0028(0.0099) | 0.0131(0.0106) | 0.0265(0.0128)* | 0.0189(0.0141) |
| 주거비 지출 | 0.0011(0.0005)* | 0.0007(0.0005) | 0.0004(0.0006) | 0.0004(0.0006) |
| 청년 고용률 | -0.0061(0.0013)*** | -0.0037(0.0013)** | -0.0041(0.0011)*** | -0.0052(0.0015)** |
| 여성 고용률 | 0.0151(0.002)*** | 0.01(0.0015)*** | 0.0068(0.0017)*** | 0.0074(0.0017)*** |
| 여성 한시적 고용 | 0.0007(0.0017) | 0.0004(0.0017) | -0.001(0.002) | -0.0005(0.0019) |
| 성별임금격차 | -0.0014(0.0018) | -0.0003(0.0019) | 0.0001(0.0021) | 0.0007(0.0023) |
| GDI | 2.5513(0.7468)** | 3.1728(0.76)*** | 4.5183(0.9216)*** | 4.2004(0.8786)*** |
| GII | 1.8146(0.3914)*** | 1.5539(0.471)** | 1.3712(0.4983)** | 1.5538(0.4666)** |
| 가족정책(현금) | 0.0973(0.0186)*** | 0.102(0.0208)*** | 0.1153(0.0221)*** | 0.1235(0.0226)*** |
| 가족정책(현물) | 0.1008(0.0274)*** | 0.0828(0.0245)** | 0.1341(0.027)*** | 0.1185(0.0306)*** |
| 가족과세비율 | -0.2009(0.085) | -0.0532(0.0876) | 0.0902(0.0985) | 0.0671(0.0887) |
| 부모휴가 | -0.0006(0.0002)** | -0.0009(0.0002)*** | -0.001(0.0002)*** | -0.001(0.0002)*** |
| 총근로시간 | 0.0002(0.0001)* | 0.0000(0.0000) | -0.0001(0.0001) | -0.0001(0.0001) |
| 40시간 미만 비율(여) | 0.0072(0.0007)*** | |||
| 40시간 미만 비율(남) | 0.0041(0.0006)*** | |||
| 20시간 미만 비율(여) | 0.0015(0.0026) | |||
| 20시간 미만 비율(남) | 0.0121(0.0077) | |||
| 상수항 | -4.1143(1.2358)** | -6.0228(1.2836)*** | -8.1288(1.4665)*** | -7.9572(1.4392)*** |
| N수 | 262 | 262 | 262 | 262 |
| Wald chi2 | 3945.48*** | 3809.06*** | 2851.46*** | 3213.52*** |
3.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분포의 매개효과(가설 4)
총근로시간의 길이가 출산율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변인이지만 근로시간 분포와 함께 투입한 대부분의 모델(Model 2~4, 6~8)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4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이들의 비중을 낮추고, 그 결과 확보된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시간자율성이 출산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매개효과모형(Mediational effect model)이 성립한다면, 기존연구에서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았던 점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표 9>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인 근로시간 분포는 주당 20~40시간 노동자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앞서의 분석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근로시간 단축의 유형이 초단시간노동 보다는 주당 20~40시간 노동의 증가를 통한 전반적 단축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9)
표 9
근로시간 분포의 매개효과
| 구분 | Model9 (독립 ⇒ 매개변수) |
Model1 (독립 ⇒ 종속변수) |
Model10 (독립, 매개 ⇒ 종속변수) |
|---|---|---|---|
| 로그 1인당 gdp | 24.8216(3.4633)*** | 0.4756(0.0818)*** | 0.2761(0.0707)*** |
| 교육비 지출 | 1.7451(0.7535)* | 0.0296(0.0118)* | 0.0141(0.0100) |
| 주거비 지출 | -0.0384(0.022) | 0.0004(0.0006) | 0.0008(0.0005) |
| 청년 고용률 | 0.0006(0.0738) | -0.0039(0.0012)** | -0.0037(0.0012)** |
| 여성 고용률 | -0.6057(0.1476)*** | 0.0066(0.0016)*** | 0.0118(0.0016)*** |
| 여성 한시적 고용 | -0.1535(0.0867) | -0.001(0.0019) | 0.0006(0.0017) |
| 성별임금격차 | 0.117(0.0898) | 0(0.0021)* | -0.0012(0.0018) |
| GDI | 89.7261(50.0705) | 4.5814(0.9344)*** | 2.7197(0.7539)*** |
| GII | -1.4385(16.8001) | 1.3588(0.4982)** | 1.6346(0.4347)*** |
| 가족정책(현금) | 3.0722(1.1489)** | 0.1148(0.0216)*** | 0.0921(0.0197)*** |
| 가족정책(현물) | 10.1785(1.7962)*** | 0.1291(0.0295)*** | 0.0754(0.0255)** |
| 가족과세비율 | 29.9081(4.9233)*** | 0.0824(0.0896) | -0.1443(0.0878) |
| 부모휴가 | -0.0039(0.0129) | -0.001(0.0002)*** | -0.0008(0.0002)*** |
| 총근로시간 | -0.0479(0.0079)*** | -0.0002(0.0001)* | 0.0000(0.0000) |
| 20~40시간 노동자 비율 | 0.0060(0.0007)*** | ||
| 상수항 | -237.9686(75.2173)** | -8.2876(1.4752)*** | -5.0788(1.2385)*** |
| N수 | 262 | 262 | 262 |
| Wald chi2 | 0.7823*** | 0.9456*** | 0.9597*** |
Model9는 매개효과모형의 독립변수인 총근로시간이 주당 20~40시간 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20~40시간 노동자 비율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총근로시간이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은 앞서 살펴본 Model1과 동일한 모형으로 유의한 영향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한 Model10에서 독립변수는 유의성이 사라졌을뿐 아니라 부호가 바뀌었고,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 모형은 직접효과(0.0000)가 총효과(0.0479)보다 크지 않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다르며,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부호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비일관적 매개모형이며, 총효과가 유의하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기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하형, 김수영, 2020). 요컨대 근로시간의 분포는 총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추가로 실행한 결과 Z값이 –4.95(p<0.00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를 - 주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봤던 기존 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2018년 OECD 19개국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5가지 가설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통제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0.05)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가설1 성립).
둘째, 총근로시간과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의 유의성은 사라졌고,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근로시간의 단축은 40시간 이상 표준적 노동과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이 공존하는 환경(양극화된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시장 참여자의 전반적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20~40시간)으로 낮아질 때(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출산율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분석자료를 근로시간 단축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근로시간의 분포의 영향은 총근로시간 자체보다 출산율을 더욱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이다(가설2 성립).
셋째, 40시간 미만 노동의 비율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투입했을 때에도 출산율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 역시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분배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가설3 성립). 20시간 미만 노동 비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가설1과 가설2를 통해 근로시간의 분포가 근로시간 총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간 수준의 근로시간 분포(주당 20~40시간)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4 성립).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이 개인과 가정의 출산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정책에 관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참여자의 복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출산시기의 개인과 가정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장 퇴장 등의 경제적 희생없이 자녀출산과 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근로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 년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의 단축에 있어서 다수의 표준적-장시간 고용과 초단시간 고용이 병립되는 상황보다는 노동시장 참여자 대부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에 출산율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초단시간 취업자(주당 15시간 미만) 비율은 지난 2000년 2.1%에서 2023년 5.6%로 증가해왔다. 물론 동기간 장시간 취업자(주당 53시간 이상) 비율은 43.7%에서 10.8%로 감소했기에 비관적이지만은 않다(통계청, 각 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를 통한 근로시간 감축은 저출산 시대의 적합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 노동이 매우 취약한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남재욱, 이다미, 2020).
셋째, 근로시간의 단축, 특히 초단시간 노동이 아닌 표준적-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그 대상이 종종 출산과 양육의 1차적 책임자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 때도 출산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저출산 관련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가정 내 성인들 간의 양육부담의 분배 문제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근로시간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은 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이 추구해온 방향 중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 규범의 확립이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도 적합한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 주 40시간(최대 52시간)에 대한 예외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장시간 노동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논의되는 주당 4.5일 혹은 4일 노동과 같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이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시장 참여자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생애 단계에 따라 제기되는 돌봄, 쉼, 학습 등 다양한 요인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결정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좀 더 강건성을 갖기 위해 향후에는 근로시간 분포가 개인의 미시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의 전반적 단축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가정 내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출산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개인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근로시간 분포’라는 요인에 주목했음에도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 ‘2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라는 제한적인 변수만을 활용하였다. 개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좀 더 미시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향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Notes
2019년 기준의 평균 출산율은 1사분면의 국가들이 1.66, 2사분면 1.69, 3사분면 1.56, 4사분면 1.54로 나타나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단일연도의 값으로 사례수가 적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과 근로시간의 좀 더 상세한 관계는 Ⅳ장의 분석에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값을 최소한의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수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을 2000~2018년으로 한 것 역시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정한 것이다.
결측을 제외하고도 최소한의 시계열을 확보한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다. 다만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시계열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자료 결측의 영향으로 국가별로 5~19년까지 편차가 나타나 시간 갭이 존재하는 불균형 패널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 결측은 단순히 자료 확보의 영향이며, 모형의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패널 균형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한치록, 2022, pp. 322-324).
동시상관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상관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역시 별도로 수행하여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동시상관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일하게 총근로시간과 40시간 미만 여성근로자 비율을 투입한 모델에서 log 1인당 GDP의 VIF가 10.9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석모형에 크 게 영향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의 표준화는 결합시계열분석 자료에 포함된 19개국의 19년간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한 OECD 17개국을 2019년 자료로 표준화한 [그림 2]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References
, &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PubMed]
, , & (2020). Women’s changing work arrangements, career paths, and marital fertility in Japan.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46, 100375. [PubMed]
(2000-2020).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 2022. 9. 30. 검색, http://oe.cd/fdb
(2019). OECD Labo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2022. 9. 30. 검색, http://oe.cd/65Y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1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4-22

- 831Download
- 236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