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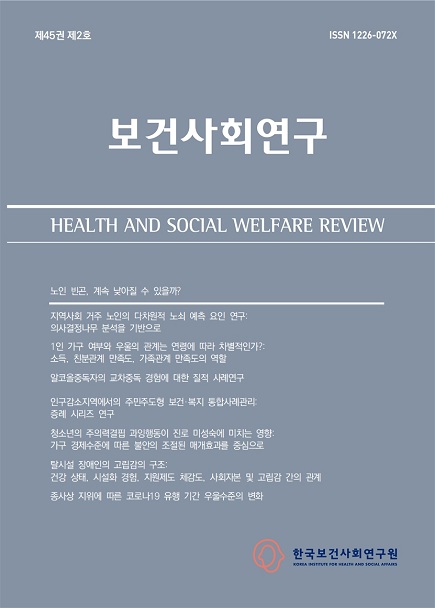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다차원적 노쇠 예측 요인 연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기반으로
A Study on Multidimensional Predictors of Frail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 Decision Tree-Based Approach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노쇠의 예방과 관리는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이다. 특히 노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패턴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쇠 예방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노쇠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주관적 건강 상태, 수면의 질,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이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노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본 연구는 밝혀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노쇠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인의 기능 상태, 건강 인식, 수면과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노쇠 예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key multidimensional predictors of frail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d propose strategies for frail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t the community level. To achieve this, a decision tre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frailty predictors based on a multidimensional frailty model and to identify key patterns that increase frailty risk.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analyzing a total of 9,951 community-dwelling adults aged 65 and old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 in distinguishing frailty status. Additionally,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 quality, educational attainment, and nutritional statu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frail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frailty prevention in healthy older adults and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for pre-frail individuals. Furthermore, th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쇠 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노쇠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여 다차원적 노쇠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쇠 예측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노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패턴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 총 9,9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 수면의 질,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군의 노쇠 예방과 전노쇠군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건강한 노년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며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고 웰빙을 지속하는 과정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노쇠(frailty)의 예방 및 관리이다. 노쇠는 단순한 신체적 노화 과정이 아니라, 다차원적 건강 상태의 저하를 반영하는 임상적 증후군으로 정의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Fried et al., 2001; Pilotto et al., 2020). 노쇠 상태에 있는 노인은 낙상, 감염, 입원, 장애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노인의 건강과 자립적 생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orley et al., 2013). 노쇠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 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노년기 개인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또한, 노쇠 상태에 있는 노인의 합병증, 장애 및 사망 위험의 증가는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율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개인의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제공자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Morley et al., 2013).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쇠는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현시점에서 노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4.6%가 노쇠 상태에 있으며, 32.2%가 전노쇠(노쇠 전 단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나 외, 2023). 이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상당수가 노쇠 위험군에 속하며,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쇠로의 진행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상대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독거 노인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더욱 높은 노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노쇠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화 자체뿐 아니라, 불균형한 영양 상태,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사회적 교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사회적 지지망,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노쇠 수준이 달라진다(하자현, 은영, 2022; Gobbens et al., 2010). 그러나 적절한 개입과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쇠는 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Sacha et al., 2017).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쇠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에 제정되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 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이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된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편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담고 있으며,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 증진과 노쇠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쇠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 저하가 아니라 다차원적 기능의 복합적 저하가 누적된 상태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Pilotto et al.(2020)의 다차원적 노쇠 모델에서도 이와 같은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등의 건강상태 요인, 음주, 흡연, 영양 등의 건강행태 요인,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IADL(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은 기능상태 요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을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노쇠 예방과 관리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강조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체계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노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쇠 진행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쇠의 진행을 늦추거나 시설 입소 및 입원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원석, 2024). 돌봄통합지원법이 지향하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aging in place)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쇠를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많은 노쇠 관련 연구들은 주로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접근법을 통해 특정 요인과 노쇠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변수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나 비선형적 관계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쇠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떠한 조합이 노쇠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이윤환, 2015).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쇠 예방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ilotto et al.(2020)의 다차원적 노쇠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노쇠 예측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노쇠 위험군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노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패턴을 규명하고자 한다(Gupta et al., 2017).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예방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노쇠 예방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쇠의 개념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특성
노쇠(frailty)는 단일한 요인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다차원적 감소가 누적됨으로써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질병의 이환을 비롯하여 장애 발생 및 사망 위험이 증가된 상태를 의미한다(Fried et al, 2001; Morley et al., 2013).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노화 과정과는 구별되며, 평생 동안 여러 생리적 시스템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 결과로서 노년기에 노쇠의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모든 노인이 반드시 심각한 노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Clegg et al., 2013). 특히, 노쇠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노인이 질병, 사고,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요양시설 입소율 및 입원율 상승, 그리고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Malmstrom et al., 2014). 따라서 노쇠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노쇠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Fried 외(2001)가 제안한 Phenotype Model은 체중 감소, 근력 감소, 만성 피로, 보행 속도 저하, 신체 활동 수준 감소를 핵심 요소로 정의하며, 이를 기준으로 노쇠 여부를 진단한다. 그리고 Rockwood 외(2005)의 Accumulation of Deficits Model은 다양한 건강 결핍 요소가 누적될수록 노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여러 노쇠를 설명하는 모델들은 노쇠를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노쇠의 복잡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Malmstrom et al., 2014; Pilotto et al., 2020).
노쇠의 중요성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쇠한 노인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개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시스템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노쇠는 삶의 질 저하, 우울증, 고립감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노쇠는 중요한 임상적 증후군임에는 분명하지만, 예방 및 조기 개입에 따라 상태 개선이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Morley et al., 2013), 건강 단계 및 전노쇠(pre-frailty)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을 할 경우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감소가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Cerreta et al., 2012). 따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노쇠 예방과 관리는 노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시설 거주 노인에 비해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노쇠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Clegg et al., 2013). 지역사회는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사회적 지지망, 경제적 상태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노쇠 상태가 크게 좌우된다(하자현, 은영, 2022; Daniels et al., 2010). 이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립성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노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Gobbens et al., 2010).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은 노인이 거주지에서 스스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다수가 보유한 만성질환이 장애 및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정연 외, 2018),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노쇠 관리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노쇠 관련 연구들과 달리, 회귀분석 대신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여부를 예측하는 다차원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차원적 노쇠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적 및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노쇠의 주요 예측 요인
노쇠는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상태로, 이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Morley et al., 2013). Pilotto et al.(2020)의 다차원적 노쇠 모델은 노쇠를 예측하 는 요인들을 다양한 영역으로 제시하며, 노쇠가 단순한 신체적 기능 저하나 결함의 축적만이 아닌, 여러 생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차원적 노쇠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 기능상태 요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여 신체 항상성 (homeostasis)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Pilotto et al., 2020).
노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독거 여부,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마승현 외, 2009; Fried et al., 2001). 성별 및 독거 여부 등은 사회적 지지망과 연결되며, 여성 노인 및 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노쇠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Jang & Kim, 2021). 교육 수준은 건강정보 접근성과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은 건강 관리에 대한 자원 부족으로 인해 노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또한 취약성이 커질수록 노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현, 은영, 2022).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은 건강 상태와 직결된 요인으로, 경제적 안정성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지 외, 2021; Pilotto et al., 2020), 거주 지역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환경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연관되어 노쇠의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Xu et al., 2021).
건강상태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우울, 인지 상태 등이 노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bbens et al., 2010).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 일수록 노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urcio et al., 2014; Zhao et al., 2020). 또한, 수면의 질 역시 노쇠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써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 및 심장병, 비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하여 노쇠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lomenos et al., 2021; Brindle et al., 2019). 또한, 우울 및 인지저하 여부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노쇠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마승현 외, 2009; 하자현, 은영, 2022; Fried et al, 2001).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여부, 그리고 영양 상태 등이 노쇠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는 노쇠와 연관된 부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영양 상태가 취약한 경우에는 노쇠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은, 허영란, 2021; Pilotto et al., 2020).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노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운동실천이 노쇠 예방에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혜지 외, 2021; 정연 외, 2018).
기능상태 요인으로는 노인기능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복잡한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지표 모두 기능적 독립성과 노쇠 간의 관계를 설명하 며, ADL 및 IADL 점수가 낮을수록 노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마승현 외, 2009; Lee et al., 2017).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 여가문화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이 노쇠와 연관된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여가문화 및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는 노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노쇠의 위험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전경숙 외, 2012; Gomes et al., 2021).
종합하여 살펴보면 노쇠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상태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쇠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측 요인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노쇠 예방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노년의 삶의 질 개선 및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다(강은나 외, 2023). 특히, 노인의 건강을 비롯하여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다차원적 노쇠에 대한 주요 예측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시점 대한민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통계청의 2021년 기준 등록 기반 가구 부문 표본추출틀(인구총조사)을 활용하여 표본추출을 통해 총 10,078명의 노인의 응답을 확보하였다(강은나 외, 2023). 본 연구의 분석에는 노쇠 측정 문항 및 예측 요인의 결측 응답이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노인 총 9,951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노쇠
종속변수인 노쇠의 상태는 노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K-FRAIL 척도(Jung et al., 2016)를 활용하였다. K-FRAIL(The Korean version of the FRAIL) 척도는 Morley 외(2012)의 FRAIL(Fatigue, Resistance, Ambulation, Illness, Loss of weight) 척도의 한국형 척도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RAIL 척도는 임상적 타당성이 보고된 바 있고, 다수의 연구를 통해 척도의 항목들이 노쇠 바이오마커와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져 온 만큼(Jung et al., 2016), 우리나라 거주 노인의 노쇠를 측정하는 데 있어 적합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0~5점의 범위를 가지며, 0점은 비노쇠(건강), 1~2점은 전노쇠(노쇠 전단계), 3~5점은 노쇠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식별하고, 예방적 개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과 이미 노쇠가 진행 중인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쇠 상태를 비노쇠 및 전노쇠 단계 이후인 노쇠로 이분화하였다. 즉, 0점인 경우 ‘비노쇠’, 전노쇠 및 노쇠 단계에 진입하여 생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상태(김원석, 2024)인 1점 이상인 경우를 ‘노쇠’로 구분하였다.
나. 노쇠 예측 요인
본 연구에 활용된 노쇠 예측 요인은 앞서 살펴본 다차원적 노쇠 모델의 범주(Pilotto et al., 2020)를 기반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 기능상태 요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요인별 세부 지표를 활용하였다(표 1).
표 1
노쇠 예측 요인
| 요인 | 지표 | 측정 방법 |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 남성/여성 |
| 독거 여부 | 독거/동거 |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 이상 | |
| 취업 여부 | 현 시점 취업 여부(취업/미취업) | |
| 소득수준 |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50% 미만 여부(빈곤/비빈곤) | |
| 거주지역 | 동부/읍면부 | |
| 건강상태 요인 | 주관적 건강상태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양호/취약) |
| 수면의 질 |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잘 잤는지 여부(양호/취약) | |
| 우울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15개 항목)(우울/비우울) | |
| 인지상태 | K-MMSE~2(표준형)(인지양호/인지저하) | |
| 건강행태 요인 | 흡연 여부 | 현재 흡연하거나 경험 유무(흡연/비흡연) |
| 음주 여부 | 지난 1년간 주 1회 이상 음주 여부(음주/비음주) | |
| 운동 여부 |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 여부(운동실천/운동미실천) | |
| 영양상태 | NSI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양호/취약) | |
| 기능상태 요인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7개 항목에서 하나 이상의 도움 필요 여부(기능양호/기능저하) |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10개 항목에서 하나 이상의 도움 필요 여부(기능양호/기능저하) | |
| 사회적 관계 요인 | 삶의 만족도 | 만족/보통이하 |
| 사회적 관계 만족도 | 만족/보통이하 | |
| 여가문화 만족도 | 만족/보통이하 |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독거 여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독거 여부는 ’독거‘ 및 ’동거‘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취업 여부는 현 시점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 및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인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빈곤‘, 그 외 ’비빈곤‘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주소상 ’동‘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부‘,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 요인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우울 및 인지상태를 포함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로 인식하는 경우 ‘양호’,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건강하지 않다’로 인식하는 경우 ‘취약’의 2개 척도로 재범주화하였다. 수면의 질은 지난 3개월 동안 잠을 잘 잤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경우 ‘양호’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취약’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이하 SGDS-K)의 총 1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SGDS-K는 0~15점의 범위를 가지며, 8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므로(강은나 외, 2023), 본 연구에서도 0~7점을 ‘비우울’, 8점 이상을 ‘우울’로 분류하였다. 인지상태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이하 K-MMSE~2) 표준형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0~30점의 범위를 가지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보정된 변환 점수를 기준으로 ‘인지저하’ 및 ‘인지양호’로 분류하였다.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여부 및 영양상태를 포함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하거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 평생 흡연한 적이 없는 경우 ‘비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음주 여부는 지난 1년 기준 주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우 ‘음주’,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음주’로 분류하였다. 운동 여부는 평소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운동 실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운동 미실천’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영양상태는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의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로 측정되었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21점을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영양관리 주의 및 개선을 의미하는 3점 이상은 ‘취약’으로 분류하였다(강은나 외, 2023).
다음으로 기능상태 요인으로는 신체적 기능 제한과 자립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포함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총 7개 항목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총 10개 항목에서 각각 하나 이상 부분 도움이나 완전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저하’, 그 외는 ‘기능양호’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및 여가문화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각각 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만족’과 ‘매우 만족’은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보통 이하’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여 예측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비모수적 통계 기법으로,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Charbuty & Abdulazeez, 2021). 이 분석 기법은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접근법에 비해 예측 요인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upta et al., 2017; Song & Ying, 2015).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방법으로,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과 같은 통계적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Gomes et al., 2021). 지니계수(Gini index)를 기준으로 불순도(impurity)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최적의 이지분리(binary split)를 수행하였고(Charbuty & Abdulazeez, 2021), 이를 통해 변수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차원적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노쇠 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기능 상태 등의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후 카이제곱 검정(Pearson’s chi-square test)을 통해 주요 변수별 노쇠 여부의 차이를 검증한 뒤, 노쇠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K-FRAIL 척도 점수에 따라 ‘비노쇠’(0점)와 ‘노쇠’(1점 이상)로 이분화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 기능상태 요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별 다양한 세부 지표를 포함하였다. 모든 분석 과정은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노인이 6,127명(61.6%)으로 남성 노인(3,824명, 38.4%)에 비해 많았으며, 동거가구(6,528명, 65.6%)가 독거가구(3,423명, 34.4%)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35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482명(35.0%), 중학교 졸업이 2,114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는 비취업자가 6,009명(60.4%)으로 취업자(3,942명, 39.6%)보다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비빈곤 집단(5,995명, 60.2%)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50% 미만인 빈곤 집단(3,956명, 39.8%)에 비해 많았다. 거주 지역은 동부 거주자가 6,977명(70.1%)으로 읍면부 거주자(2,974명, 29.9%)보다 많았다.
건강상태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취약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838명(58.7%)으로,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4,113명, 41.3%)보다 많았으며, 수면의 질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265명(83.1%)으로 취약하다고 응답한 경우(1,686명, 16.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비우울이 8,849명(88.9%)으로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1,102명, 11.1%)보다 많았고, 인지 상태는 인지양호(7,503명, 75.4%)가 인지저하(2,448명, 2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특성에서는 비흡연 집단이 6,724명(67.6%)으로 흡연 집단(3,227명, 32.4%)보다 많았고, 비음주 집단 이 8,702명(87.4%)으로 음주 집단(1,249명, 12.6%)보다 많았다. 운동의 경우, 운동 실천 집단이 5,339명(53.7%)으로 운동 미실천 집단(4,612명, 46.3%)보다 약간 많았으며, 영양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7,100명(71.3%)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경우(2,851명, 28.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특성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양호한 경우가 9,228명(92.7%)으로 기능저하(723명, 7.3%)보다 많았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역시 양호한 경우가 8,303명(83.4%)으로 기능저하(1,648명, 16.6%)보다 많았다. 사회적 관계 특성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노인이 5,968명(60.0%)으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노인(3,983명, 40.0%)보다 많았다. 여가문화 만족도에서도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노인이 6,799명(68.3%)으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노인(3,152명, 31.7%)보다 많았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역시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노인이 5,368명(53.9%)으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노인(4,583명, 46.1%)보다 많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쇠 여부
| (n=9,951) | |||||||||
|---|---|---|---|---|---|---|---|---|---|
| 변수 | 전체 | 노쇠 여부 | |||||||
| 비노쇠 | 노쇠 | χ2 | ρ | ||||||
| n | % | n | % | n | % |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
| 성별 | 남성 | 3,824 | 38.4 | 2,695 | 70.5 | 1,129 | 29.5 | 137.29 | <.001 |
| 여성 | 6,127 | 61.6 | 3,605 | 58.8 | 2,522 | 41.2 | |||
| 독거 여부 | 독거 | 3,423 | 34.4 | 1,873 | 54.7 | 1,550 | 45.3 | 165.84 | <.001 |
| 동거 | 6,528 | 65.6 | 4,427 | 67.8 | 2,101 | 32.2 | |||
| 교육 수준 | 초등학교 | 4,355 | 43.8 | 2,165 | 49.7 | 2,190 | 50.3 | 657.51 | <.001 |
| 중학교 | 2,114 | 21.2 | 1,450 | 68.6 | 664 | 31.4 | |||
| 고등학교 | 3,482 | 35.0 | 2,685 | 77.7 | 797 | 22.9 | |||
| 취업 여부 | 취업 | 3,942 | 39.6 | 2,841 | 72.1 | 1,101 | 27.9 | 215.65 | <.001 |
| 비취업 | 6,009 | 60.4 | 3,459 | 57.6 | 2,550 | 42.4 | |||
| 소득 수준 | 빈곤 | 3,956 | 39.8 | 2,134 | 53.9 | 1,822 | 46.1 | 248.03 | <.001 |
| 비빈곤 | 5,995 | 60.2 | 4,166 | 69.5 | 1,829 | 30.5 | |||
| 거주지역 | 동부 | 6,977 | 70.1 | 4,628 | 66.3 | 2,349 | 33.7 | 91.78 | <.001 |
| 읍면부 | 2,974 | 29.9 | 1,672 | 56.2 | 1,302 | 43.8 | |||
| 건강 상태 요인 | |||||||||
| 주관적 건강 상태 | 양호 | 4,113 | 41.3 | 3,246 | 78.9 | 867 | 21.1 | 735.47 | <.001 |
| 취약 | 5,838 | 58.7 | 3,054 | 52.3 | 2,784 | 47.7 | |||
| 수면의 질 | 양호 | 8,265 | 83.1 | 5,644 | 68.3 | 2,621 | 31.7 | 520.35 | <.001 |
| 취약 | 1,686 | 16.9 | 656 | 38.9 | 1,030 | 61.1 | |||
| 우울 | 우울 | 1,102 | 11.1 | 309 | 28.0 | 793 | 72.0 | 663.67 | <.001 |
| 비우울 | 8,849 | 88.9 | 5,991 | 67.7 | 2,858 | 32.3 | |||
| 인지 상태 | 인지양호 | 7,503 | 75.4 | 5,104 | 68.0 | 2,399 | 32.0 | 292.01 | <.001 |
| 인지저하 | 2,448 | 24.6 | 1,196 | 48.9 | 1,252 | 51.1 | |||
| 건강행태 요인 | |||||||||
| 흡연 여부 | 흡연 | 3,227 | 32.4 | 2,234 | 69.2 | 993 | 30.8 | 72.01 | <.001 |
| 비흡연 | 6,724 | 67.6 | 4,066 | 60.5 | 2,658 | 39.5 | |||
| 음주 여부 | 음주 | 1,249 | 12.6 | 911 | 72.9 | 338 | 27.1 | 57.00 | <.001 |
| 비음주 | 8,702 | 87.4 | 5,389 | 61.9 | 3,313 | 38.1 | |||
| 운동 여부 | 운동실천 | 5,339 | 53.7 | 3,694 | 69.2 | 1,645 | 30.8 | 171.39 | <.001 |
| 미실천 | 4,612 | 46.3 | 2,606 | 56.5 | 2,006 | 43.5 | |||
| 영양 상태 | 양호 | 7,100 | 71.3 | 4,972 | 70.0 | 2,128 | 30.0 | 481.49 | <.001 |
| 취약 | 2,851 | 28.7 | 1,328 | 46.6 | 1,523 | 53.4 | |||
| 기능 상태 요인 | |||||||||
| ADL | 기능양호 | 9,228 | 92.7 | 6,161 | 66.8 | 3,067 | 33.2 | 652.31 | <.001 |
| 기능저하 | 723 | 7.3 | 139 | 19.2 | 584 | 80.8 | |||
| IADL | 기능양호 | 8,303 | 83.4 | 5,820 | 70.1 | 2,483 | 29.9 | 993.61 | <.001 |
| 기능저하 | 1,648 | 16.6 | 480 | 29.1 | 1,168 | 70.9 | |||
| 사회적 관계 요인 | |||||||||
| 삶 만족도 | 만족 | 3,983 | 40.0 | 3,020 | 75.8 | 963 | 24.2 | 447.59 | <.001 |
| 보통 이하 | 5,968 | 60.0 | 3,280 | 55.0 | 2,688 | 45.0 | |||
| 여가문화 만족도 | 만족 | 3,152 | 31.7 | 2,330 | 73.9 | 822 | 26.1 | 223.62 | <.001 |
| 보통 이하 | 6,799 | 68.3 | 3,970 | 58.4 | 2,829 | 41.6 | |||
| 관계 만족도 | 만족 | 4,583 | 46.1 | 3,194 | 69.7 | 1,389 | 30.3 | 148.98 | <.001 |
| 보통 이하 | 5,368 | 53.9 | 3,106 | 57.9 | 2,262 | 42.1 |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쇠 여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쇠 여부를 분석한 결과, 남성(χ²=137.29, p<.001)보다 여성에서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41.2%). 독거노인(χ²=165.84, p<.001)인 경우 동거노인보다 노쇠 비율이 높았으며(45.3%), 교육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χ²=657.51, p<.001)에서 노쇠 비율이 가장 높았다(50.3%). 취업 여부는 비취업자(χ²=215.65, p<.001)가 취업자보다 노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2.4%),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보다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χ²=248.03, p<.001).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노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91.78, p<.001).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경우(χ²=735.47, p<.001), 수면의 질이 취약한 경우(χ²=520.35, p<.001),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χ²=663.67, p<.001), 그리고 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χ ²=292.01, p<.001)에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의 노쇠 비율은 72.0%로, 비우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 요인에서는 비흡연(χ²=72.01, p<.001), 비음주(χ²=57.00, p<.001), 운동 미실천(χ²=171.39, p<.001) 집단에 속하는 노인이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 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 비율은 53.4%로, 양호한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χ²=481.49, p<.001).
기능상태 요인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기능저하인 경우(χ²=652.31, p<.001),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기능저하인 경우(χ²=993.61, p<.001)에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ADL이 기능저하인 경우 노쇠 비율은 80.8%, IADL이 기능저하인 경우 노쇠 비율은 70.9%로 나타나 기능상태에 따른 노쇠 여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관계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χ²=447.59, p<.001), 여가문화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경우(χ²=223.62, p<.001),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경우(χ²=148.98, p<.001)에서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집단의 노쇠 비율은 45.0%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 (24.2%)에 비해 약 20.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집단에서 노쇠 비율은 41.6%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26.1%)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 또한 보통 이하인 경우 노쇠 비율은 42.1%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30.3%)에 비해 약 1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 독거 여부,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운동, 영양 등의 건강행태, 기능상태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
3.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노쇠 여부를 분류한 결과, 전체 정확도는 73.8%, 비노쇠 그룹에서 88.0%, 노쇠 그룹에서 49.2%로 나타났다. 분류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한은정 외, 2014), 88.0%로 나타난 비노쇠 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모델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델의 전체 위험도 추정값은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타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이상 미, 2024), 본 연구에서 위험도 추정값은 .262로 비교적 낮아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이 노쇠 여부를 분류하는 데 있어 적절하며, 노쇠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
표 3
노쇠 여부 분류의 위험도표
| 관측분류 | 예측분류 | ||
|---|---|---|---|
| 비노쇠(n) | 노쇠(n) | 정확도 퍼센트(%) | |
| 비노쇠(n) | 5,544 | 756 | 88.0 |
| 노쇠(n) | 1,853 | 1,798 | 49.2 |
| 전체(%) | 74.3 | 25.7 | 73.8 |
| 위험도 추정값(표준화 오류) | .262(.004) | ||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고, 목표 범주인 노쇠에 속하는 사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익차트(Gain Chart)를 분석하였다(그림 1). 이익차트에서 굵은 선은 모형 곡선으로, 상위 약 30% 데이터에서 이익이 약 6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목표 범주인 노쇠를 효율적으로 예측 가능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노쇠 여부를 예측한 결과(그림 2), 최상위 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변수 중 노쇠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IADL에서 기능저하가 있는 집단의 경우, 노쇠 비율이 70.9%로, IADL에 기능저하가 없는 기능양호 집단(29.4%)에 비해 약 2.4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IADL 기능저하 집단의 경우, 다음 분류 기준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 비율이 7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노쇠 비율 은 4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여성 노인(56.2%)의 노쇠 비율이 남성 노인(34.0%)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IADL 기능양호 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수면의 질이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면의 질도 양호한 집단에서는 노쇠 비율이 19.3%로 낮았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 비율이 38.9%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면의 질이 취약한 집단에서는 노쇠 비율이 57.5%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노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 집단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경우 노쇠 비율은 58.4%로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에서는 영양상태가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 비율이 56.2%로 증가하는 반면 영양상태가 양호한 집단은 34.7%로 노쇠 비율이 감소하였다.
목표 범주인 노쇠 여부를 기준으로 각 노드에서 관측값과 이득, 반응률, 지수를 기반으로 노쇠에 속하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식별했는지를 노드에 대한 이익도표(Gains Table for Nodes)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표 4). 반응률이 높을수록 해당 노드가 노쇠 여부를 더 잘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00%보다 큰 지수값은 전체 백분율보다 노쇠에 속하는 사례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Upadhyaya et al., 2018).
표 4
노드별 이익도표(Gains Table for Nodes)
| 노드 | 노드 | 이득 | 반응(%) | 지수(%) | ||
|---|---|---|---|---|---|---|
| n | % | n | % | |||
| 3 | 1,349 | 13.6 | 1,036 | 28.4 | 76.8 | 209.3 |
| 13 | 565 | 5.7 | 385 | 10.5 | 68.1 | 185.7 |
| 19 | 68 | 0.7 | 46 | 1.3 | 67.6 | 184.4 |
| 15 | 435 | 4.4 | 254 | 7.0 | 58.4 | 159.1 |
| 7 | 137 | 1.4 | 77 | 2.1 | 56.2 | 153.2 |
| 20 | 53 | 0.5 | 22 | 0.6 | 41.5 | 113.1 |
| 16 | 1,312 | 13.2 | 467 | 12.8 | 35.6 | 97.0 |
| 18 | 259 | 2.6 | 90 | 2.5 | 34.7 | 94.7 |
| 8 | 162 | 1.6 | 55 | 1.5 | 34.0 | 92.5 |
| 12 | 1,797 | 18.1 | 484 | 13.3 | 26.9 | 73.4 |
| 6 | 3,814 | 38.3 | 735 | 20.1 | 19.3 | 52.5 |
분석 결과, 노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인 가장 상위에 위치한 노드는 3번 노드로 나타났다. IADL 기능저하가 있으면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전체 노쇠 사례 중 약 28.4%를 포함하며, 평균보다 약 2배 더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3번 노드로, IADL 기능은 양호하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전체 노쇠 사례의 10.5%를 차지하며, 노쇠 여부를 잘 예측하는 또 다른 주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노쇠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집단으로는 노드 6번과 12번을 들 수 있으며, IADL 기능양호와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수면의 질 양호와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도 여전히 약 27%의 노쇠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노쇠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쇠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노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노쇠 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였다. 특히, Pilotto et al.(2020)의 다차원적 노쇠 모델을 기반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 기능상태 요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울 포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노쇠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쇠 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어 온 노쇠 예측 요인의 다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Morley et al., 2013; Pilotto et al., 20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 노인, 독거 노인, 읍면부 거주 노인, 비취업자인 경우가 노쇠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한 경우 노쇠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마승현 외, 2009; Fried et al., 2001). 다음으로 건강상태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의 질이 취약한 경우 노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상이 있거나 인지저하가 있는 경우 노쇠에 속할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행태 특성에서는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경우, 비음주자인 경우,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영양 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상태 특성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저하가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게(마승현 외, 2009; Lee et al., 2017) 노쇠 여부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사회적 관계 만족도 및 여가문화 만족도가 낮은 경우 노쇠의 취약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경숙 외(2012) 및 Gomes et al.(2021)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의 취약함은 노쇠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노쇠 여부를 예측한 결과, 최상위 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변수 중 노쇠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IADL에서 기능저하가 있는 집단의 경우, 노쇠 비율이 70.9%로, IADL에 기능저하가 없는 기능양호 집단(29.4%)에 비해 약 2.4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노인의 기능적 독립성과 노쇠 간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 지표로써 IADL을 강조한 마승현 외(2009) 및 Lee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IADL 기능저하 집단과 IADL 기능양호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쇠의 주요한 예측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IADL 기능저하 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하면 노쇠 비율이 76.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능저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의 경우에는 노쇠 비율이 44.1%로 나타났다. IADL 기능양호 집단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에는 노쇠 비율이 38.9%로, 적지 않은 노쇠의 위험 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실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노쇠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Curcio et al., 2014; Zhao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IADL 기능양호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수면의 질, 교육수준 및 영양상태 등이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집단에서 수면의 질이 양호할 경우에는 노쇠 비율이 34.0%였으나, 수면의 질이 취약한 경우에는 노쇠 비율이 57.5%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면서 인지저하가 있는 경우 노쇠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상태가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쇠 예방에 있어 수면의 질, 교육수준 및 영양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김예은, 허영란, 2021; Balomenos et al., 2021).
마지막으로, 노드에 대한 이익도표를 분석한 결과, 노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인 가장 상위에 위치한 노드는 3번 노드로 나타났다. IADL 기능저하가 있으면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노쇠의 위험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ADL 기능은 양호하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또한 노쇠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IADL 기능양호와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수면의 질 양호와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쇠 위험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도 여전히 약 27%의 노쇠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쇠 전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한 논의이다.
첫째,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군의 예방적 개입과 전노쇠군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노쇠 여부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IADL 기능 점검이 필요하며,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영양상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노쇠 위험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노쇠 예측 요인을 중심으로 선제적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노쇠 관련 정책이 주로 노쇠가 진행된 이후의 치료나 관리에 집중되었다면, 노쇠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개입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이윤환, 2015).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 평가 및 개입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쇠 위험이 감지된 경우 가정 방문형 재활 서비스, 기능 회복 운동 프로그램, 맞춤형 생활 보조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노쇠 속도를 늦추는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 즉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노쇠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건강 인식이 실제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건강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노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증진 캠페인을 통해 노인의 건강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관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노쇠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면의 질과 영양 상태는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쇠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만큼,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면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면 장애를 겪는 노인을 위해 수면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의료적 개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양관리의 경우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내 급식 서비스, 영양 상담, 식단 조절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급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식료품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건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쇠 위험이 유의하게 높인 집단, 즉 독거노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노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 등의 경우, 사회적 참여와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쇠 관련 정책은 주로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홍선미, 장숙랑, 2023). 특히,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분절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및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노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미 활동, 그룹 운동 지원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가요이노바(Kayoi-no-ba)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노쇠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인구기반 접근 전략을 도입하여 가요이노바를 도입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화와 노쇠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Uemura et al., 2023).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와 운동 실천을 동시에 유도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단순히 신체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본 연구는 횡단자료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한 만큼,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보다는 상관관계 및 예측 가능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즉,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다양한 예측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구조적 패턴이 노쇠 위험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쇠를 유발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인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나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쇠 예방 및 관리 전략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쇠를 측정하기 위해 K-FRAIL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노쇠 평가를 위해 설문 기반의 자기 보고식 평가도구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나 기능적 평가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노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체 신호 데이터, 신체 성분 분석, 보행 속도 측정 등의 노쇠 바이오마커를 포함할 경우, 노쇠의 연속적인 진행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개인별 노쇠 변화 과정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노쇠 경로를 분석하고, 개입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복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위험률을 높이는 변수 간 상호작용과 구조적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특히, IADL 기능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주관적 건강 인식 개선, 수면 질 및 영양 상태 관리, 노쇠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은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며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건강한 노년이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하는 데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우리 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 , , , , , , , , , , & (2021). Association between sleep disturbances and frailty: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22(3), 551-558. [PubMed]
(2024. Sep. 3). Healthy Aging at Any Age. https://www.cdc.gov/healthy-aging/about/index.html
, , & (2012). Drug policy for an aging population—the European Medicines Agency's geriatric medicines strateg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7(21), 1972-1974. [PubMed]
, , , , & (2013). Frailty in elderly people. The Lancet, 381(9868), 752-762. [PubMed]
, , , , , , , , , , &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56(3), M146-M157. [PubMed]
, , , & (2010). Toward a conceptual definition of frail community dwelling older people. Nursing Outlook, 58(2), 76-86. [PubMed]
, , , , , & (2020). Poor self-perceived health is associated with frailty and prefrailty in urban living older adults: A cross-sectional analysis. Geriatric Nursing, 41(6), 754-760.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3-07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3-26

- 626Download
- 957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