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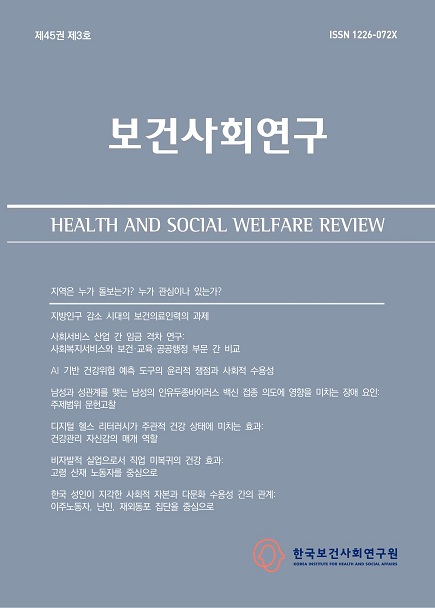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제45권 제3호Vol.45, No.3
Choi, Young Ju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3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2.1
Yoon, Taeho(Pusan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1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Um, Dawo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ang, Yunseon(Sungkyunkw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7-4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7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a core segment with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and other sectors including health,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persistent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 prior studies have predominantly relied on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rather than industry-level comparisons, resulting in largely descriptive analyses and limited empirical investigations into wage disparities. Using the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between 2013 and 2023, we longitudinally analyse trends of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core and other sectors 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was applied to analyse mean wage differentials, while distributional differences were examined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and the Oaxaca-Blinder metho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hourly wage gap has gradually narrowed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gap in monthly earnings has widened. Moreover, changes in the magnitude and structure of wage differentials varied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with shifts in the workforce composition with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policy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the compensation structure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 핵심 부문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주변 부문인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산업보다는 직종을 중심으로 비교하거나, 임금수준의 실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의 수준과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Oaxaca-Blinder 분해를 사용한 평균 임금 격차를,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결합한 분해방법을 사용해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월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임금 격차의 크기와 구조의 변화는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Lim, Jae Kang(Former Professor of Kyungwoo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3-6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3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issues and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health risk prediction tool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South Korea, and China. While such tools offer transformative potential for early disease detection, personalized treatment, and healthcare resource optimization, they also pose significant ethical challenges, including concerns over data governance (privacy, security, consent), algorithmic integrity (bias,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ccountability, and the risk of discrimin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se regions share common concerns, they differ in their normative priorities: the EU emphasiz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the US focuses on health equity, China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and South Korea seeks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Social acceptance also varies widely: China shows high optimism for medical AI, while the West expresses concerns, and South Korea remains cautious. Regulatory approaches reflect these differences, with the EU adopting comprehensive ex-ante regulation, the US favoring a sector-specific approach, China pursuing goal-oriented control, and South Korea implementing a risk-based framework. These variations are shaped by cultural norms, political structures, economic priorities, and technological readiness, offering key insights for global AI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ross-border policy alignment.
초록
이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위험 예측 도구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미국, 유럽 연합(EU),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AI 예측 도구는 질병의 조기 발견, 맞춤 치료, 의료 자원 최적화 등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지만,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보안, 동의), 알고리즘 건전성(편향,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 소재 규명, 차별 가능성 등 복잡한 윤리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윤리적 우려를 공유하지만, 기본권 보호(EU), 건강 형평성(미국), 사회 안정(중국), 혁신-규제 균형(한국) 등 강조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수용성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중국의 높은 낙관론과 미국과 EU의 우려와 한국의 신중론 등 차이를 나타냈다. 규제 방식에서도 EU의 포괄적 사전 규제, 미국의 분산적 접근, 중국의 목표 지향적 규제, 한국의 위험 기반 접근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 정치 시스템, 경제 전략, 기술 발전 속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국제 협력, 시장 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Kim, Hye-Min(Ewha Womans University) ; Chae, Won-Jeong(Kongju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68-8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68
Abstract
This scoping review aimed to identify and synthesize the barriers that influenc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intention among unvaccinated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using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s from 2015 to 2024. Ten peer-reviewed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ed four overarching thematic categories with twelve corresponding subthemes: financial barriers, such as high vaccination cost; healthcare provider-related factors, including lack of proactive recommendation; cognitive factors, including limited knowledge or awareness of HPV risks and vaccine benefits;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internalized stigma and uncertainty about sexual identity. This review highlights the multifaceted and intersecting nature of the barriers that MSM face in forming vaccination intentions, moving beyond a simple listing of individual factors. It emphasizes the need for multi-layered, culturally responsiv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hat address both structural and psychosocial determinants. Notably, the review identifies a significant research gap within the Korean context, where no relevant empirical studies were found. Therefore, it calls for the urgent development of localized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ies. Recommendations include providing inclusive and accessible health information, implementing LGBTQ+-sensitive provider training, and establishing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to reduce cost-related barriers. These strategies may contribute to improving vaccine uptake and advancing health equity among sexual minority popula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national public health agendas.
초록
본 연구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 중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0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장애 요인은 재정적 요인, 보건의료전문가 관련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4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MSM의 낮은 백신 접종률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및 심리사회적 장벽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HPV 백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실정을 반영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건강정보 제공, 의료진 대상의 교육, 비용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hin, Chaeeun(Kongju National University) ; Kim, Kyoung-Hoon(Kongju National University) ; Song, Inmyung(Kongju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87-103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87
Abstract
Background: Digital health literacy refers to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health information through digital media.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digital health information affects health status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Methods: The study used microdata from the 20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Digital Health Accessibility and Personal Competency Factors." A total of 936 participants aged 20 to 69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gital health literacy, the mediator was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ubjective health status. Results: For every 1-point increase in digital health literacy, subjective health status increased by 0.022 points and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increased by 0.108 points (p<0.0001). The indirect effect of digital health literacy on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was 0.019 points, with 48.62% of the total effect explained by the mediation effect. Conclusion: Digital health literacy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domestic evidence that digital health literacy can influence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초록
연구 배경: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건강관리 자신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분석한다. 방법: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디지털 헬스 접근성 및 개인 역량 요인에 대한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69세 93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매개변수는 건강관리 자신감,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이다. 결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주관적 건강 상태는 0.022점, 건강관리 자신감은 0.108점 증가하였다(p<0.0001).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관리 자신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0.019점이었고, 총 효과의 48.62%가 매개 효과로 설명되었다. 결론: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관리 자신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관리 자신감을 통해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 최초의 근거를 제공한다.
Choi, Seoyoung(Sog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04-125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0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turn to work on the health recovery of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on the return-to-work outcomes of injured worker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verse relationship—that is, how return-to-work outcomes affect health recovery. Howeve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not only a means of livelihood but also an opportunity to access a variety of social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failure to return to work can serve as a trigger for resource depriv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non-return to work influences health outcomes among older injured workers, a group that is both more vulnerable in terms of health and faces greater barriers to reemployment. To this end,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s(DDD) designs with propensity score-based weight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eturn to work on health recovery is more pronounced among workers aged 60 and above. Moreover, even when these workers returned to jobs with less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compared to their pre-injury positions, return to work still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covery than non-retur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dden labor market exit due to work-related health problems is particularly detrimental to the health of older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for older injured workers, and when return is not feasible, to provide programs that help maintain livelihood, social relationships, and physical activity so as to prevent th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of labor market exi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건강 상태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지만, 반대로 직업 복귀 성과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는 생계 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직업 복귀 실패는 다양한 자원 박탈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를 적용한 이중·삼중 차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60대 이상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더 뚜렷했고, 이들은 재해 당시보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에도 미복귀보다 복귀가 건강 회복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퇴장이 고령층의 건강에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직업 미복귀가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낳지 않도록 생계와 사회관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Kwak, YoonKyung(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Yang, Youngmi(Korea Social Convergence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26-14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26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apital among Korean adult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ree distinct migrant groups: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Specifically, it seek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haped differently across these migrant categories by focusing on the sub-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Social Cohesion and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a sample of 3,011 Korean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both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oward refugees,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generation, educational attainment, subjective income level,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foreigners, were found to have varying influ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migrant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heterogeneous nature of multicultural attitudes within Korean society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different migrant population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이주민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 3,0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Kang, Chulhee(Yonsei University) ; Choi, Seong Eo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47-16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47
Abstract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in contributing to the public good but also in enhanc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fostering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the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remains at a relatively low level. To promote wide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buil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among older adult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those of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pplying an analytical method that reflects the data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ndard Negative Binomial model fails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excess zero values—representing non-participation—which may lead to inaccurate estim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In contrast,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hich is better suited to data with an excessive number of zeros, yields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Specifically, only educational attainment (positive), housing status (renter),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and institutional trust (negativ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sity of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in the zero-inflated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achie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lder adults’ volunteer behavior, it is crucial to apply analytical approaches that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study underscores that the appropriate choice and application of statistical models are essential tasks in the knowledge-building process.
초록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상에 대한 이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자료 속성에 맞춘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은 과도하게 분포된 0값,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명 변수의 영향력이 정교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졌다. 반면, 과도한 0값이 다수 분포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은 음이항 회귀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거주형태(임차가구), 우울감(-), 제도신뢰(-)만이 노인 자원봉사 참여 강도를 설명하는 변수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지식의 구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과제란 사실을 제시해준다.
Song, Dohun(Jeonbuk National University) ; Jeong, Kyu-Hyoung(Je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Yiseul(Jeonbuk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68-19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6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tential types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young adults living alone a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m. We analyzed data from 5,355 young adults aged 19-34 living alone, using the 2022 Youth Life Survey. Employ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we categorized social exclusion among these young adult households into three types: (1) employment, housing, and economic exclusion, (2) multiple exclusion, and (3) partial health and housing exclusion. For each type, the key determinants identified were gender, education level, region of residence, disposable income, and personal deb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is multidimensional, with interrelated effects including employment and economic insecurity, housing vulnerability, poor health, and social isol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초록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ata/MP 17.0과 Mplus 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9~34세 청년 1인가구 5,355명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다중배제형’,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성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가처분소득, 개인 부채 등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이 확인되었다.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특성을 띠며, 특히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 주거 취약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상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차원으로 포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Ryu, Ju Yeon(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Joo, Yeon Sun(Pai Cha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93-21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9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and private professionals identify and support individuals at risk of solitary death, in order to draw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0 public officials and 7 social workers involved in solitary death-related work, recruited via community referra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analysis yielded 4 major themes and 15 subcategories. Focusing on the major themes, we found that recognizing the widening gaps in services is critical. However,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ose at risk are increasing, and even when they are identified, providing adequate support remains difficult. Furthermore,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a human safety net involving neighbors, along with a systematic and collaborative service delivery system, to better identify and support those at risk.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continue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solitary death risk groups, expanding resources to address service gaps,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to prevent solitary death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및 민간 전문가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추천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10명과 사회복지사 7명을 선정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대주제와 1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대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넓어지는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인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과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원의 확대, 지역주민 참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Yoon, Eunsil(Formerl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Song, Yeongchae(Seoul National University) ; An, Gijong(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 ; Do, Young 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218-24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218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selection pathway―a causal mechanism through which patient experience measurement and public reporting promote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care systems by influencing patients' choice of healthcare providers―and to identify key areas for improving the patient-centeredness in the healthcare system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an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patients, followed by thematic analysis. The analysis yielded twelve subthemes categorized under three main themes: i)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ii) comprehensive improvement for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survey systems, and iii) tasks for improving patient-centeredness in the healthcare system. Patients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necessity and value of the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while also identifying areas of improvement to better activate the selection pathway. Furthermore, participants proposed long-term strategies for promoting a more patient-centered healthcare system, including comprehensive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reforms in medical education, and systemic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rectly involved patie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the Patient Experience Assessment and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how effectively the selection pathway operates and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초록
이 연구는 환자경험 평가와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연결하는 이론적 인과 기전 중 하나인 선택 경로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규명하고,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환자 대상 초점집단토의와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환자경험 평가의 포괄적 개선방안', '보건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과제'의 세 가지 주제로 포괄되는 12개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환자들은 환자경험 평가의 필요성과 가치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선택 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개선 과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향후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포괄적인 의료의 질 향상, 의학교육 개선, 전반적 의료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환자경험 평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 경로의 작동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o, Jinsun(GoodWithUs Corporation) ; Choi, Ahyoung(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 Hong, Seojoon(Dongseou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241-26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241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how young adults’ mental health is affected by personal and social factor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survey of individuals aged 20 to 39,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Among personal factors, economic level, life satisfaction, positive emotions, and negative emo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mental health. Among social factor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solation, and social depr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status is an important external factor,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negative emotions are key internal factors,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solation are critical social factors affecting young adults’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ng adults’ ment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39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개인적 요인 중 경제 수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요인 중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 외적 요인은 경제 수준, 개인 내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 긍·부정 정서, 사회적 요인은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은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Ha, Jung-Hwa(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Changsook(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265-29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26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coaching program to guide advance care planning (ACP)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in Korea. To this end, we first analyzed five ACP guidance program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We identified the core components of these programs―including context, conceptual model, intervention, theory, mechanisms of action, and outcomes―using a logic model proposed by Lin et al. (2019). Programs in other countries typically focused on explaining the progression of dementia, assess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dementia among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identifying the values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regarding end-of-life care, and clarifying their goals of care in light of their values and preferenc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eveloped a Korean ACP coaching program. During this process, we incorporated feedback from professionals working in dementia care settings. The core elements of the program were adapted to fit the Korean cultural context. The detailed program protocol was developed using the same logic model we used in analyzing previous research. The program we developed aims to provide support for not only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but also the broader older adult population, with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ir values and preferences regarding end-stage dementia care and to discuss these matters with their families or care providers.
초록
본 연구는 국외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사전돌봄계획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외 프로그램들에서는 치매의 질병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 파악, 임종기 돌봄과 관련한 치매 환자의 가치와 선호 파악,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 및 돌봄 목표(goals of care)를 파악하는 것이 개입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적 맥락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치매 노인 돌봄 현장 및 학계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프로토콜은 로직 모델을 활용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이 치매 말기의 돌봄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와 선호를 미리 생각해보고, 이를 가족 또는 돌봄제공자와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Yu, Seunghee(Kookmi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293-31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293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cognitive factors on these change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analysis was based on data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focusing on 3,962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The rate of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men than women.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had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Higher level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acceptanc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life satisfaction, but the rate of increase was attenuated.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was linked to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whereas effort due to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levels. Household income,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convenience of residential area, and emotional support from others all contributed to higher initial life satisfaction. However, emotional support from others was also found to moderate the rate of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Greater social isol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improvements in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초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의 성인장애인 3,9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일정하게 증가했다.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여성장애인보다 높았다.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낮았다. 장애에 대한 인지와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나,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완화되었다. 감정표출 억제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감소했으나, 장애로 인한 노력은 삶의 만족도 초기치를 증가시켰다. 가구소득, 가족의 정서적 지지, 거주지역 편리,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를 높였으나,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증가율을 완화시켰다. 사회적 분리가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감소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Rhee, YungSeon(Chosu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317-333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317
Abstract
Background: Health literacy is a key factor in achieving health equity, and its importan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Medical Aid recipien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1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n Health Panel (KHP) to examine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Results: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mbers, especially in areas requiring complex understanding such as disease-related information search, determining the need for further treatment, and managing mental heal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education level, anxiety, subjectiv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and access to a regular healthcare provider as significant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vulnerability of Medical Aid recipients in health literacy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
초록
배경: 건강 정보 이해력은 건강 형평성 실현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방법: 제2기 한국 의료 패널 2021년 부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질병 관련 정보 탐색,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 정신건강 관리 등 복합적 정보 이해가 요구되는 항목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상용 치료기관 여부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건강 정보 접근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Kim, Miok(Ju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Goeun(Kwangwoon University) ; Jung, Eunhye(Korea Nazaren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334-356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334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mong staff members at day service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upport challenging behaviors. Data from 305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which is well-suited for intuitive explor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were found among staff working in environments with a high proportion of users exhibiting challenging behaviors, frequent daily challenging behaviors, and limited training. Even when ample training was provided, staff members who had frequent experiences of injury reported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Additionally, staff in institutions with lower proportions of users showing challenging behaviors but with frequent physical interventions, frequent injury experiences, and a lack of individualized behavior support plans also reported higher negative emotions. These findings identify key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mong staff supporting challenging behavior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effective support strategies.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감정 예측요인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직관적 해석에 용이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나타나는 이용자가 많으며 교육이 적은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교육을 다수 제공하더라도 종사자 상해경험이 많으면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아도 신체적 개입을 많이 수행하거나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종사자 상해 경험이 잦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의 집단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Choi, Jih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rk, Eunj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 J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Eunice Ho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wak, YoonKy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un, Heeran(Jungwon University) ; Lee, Nag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357-38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357
Abstract
South Korea, which had previously discussed it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has now become one. Since the mid-2000s,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consistently accounted for around 10% of all marriages annually, and female marriage migrants have become a significant demographic group within Korean society. However, academic and policy interest in these women has not adequately reflected this societal shift. This study conducted a scoping review of academic research on the health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starting from 2004.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ie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 research on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aiming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levant studies and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policies for women. The analysis revealed a concentration of published studies during the early phas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1st and 2nd phases). There was an imbalance between studies assessing basic health status and those exploring health determinants. Moreover, there was a lack of intervention studies and nationwide surveys that could serve as evidence for health policy. To identify the wide range of health issues facing female marriage migrants and to accumulate reliable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xpand the quantity of related studies but also to enhance their quality.
초록
다문화사회 이행을 논했던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로 완전하게 진입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국제결혼의 규모는 매해 전체 결혼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인구 집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술·정책적 관심은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결혼이주여성 건강 관련 학술연구에 대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 및 방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국내 결혼이주여성 건강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관련 연구 촉진과 근거 기반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초기(1·2차)에 연구가 집중된 경향을 보였고, 건강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보다 건강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건강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재연구, 전국 단위 조사 연구도 적은 수준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건강 쟁점을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와 함께 건강 결과와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Ahn, Seon-Kyeong(Ewha Womans University) ; Kim, Soyoun(Ewha Womans University) ; Chung, Ick-Joong(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383-408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383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Latent Class Analysis (LCA) to classify types of adverse experiences in adulthood among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across these groups. Using data from the 2022 Seoul Metropolitan City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Survey, 447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ampl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dverse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among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Complex Adversity Type (n=131, 29.3%), Employment Frustration Type (n=143, 32.0%), Relationship Conflict Type (n=75, 16.8%), and Low-Risk Type (n=98, 21.9%). Second,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ypes in ag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use of mental health medication, and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among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factors. Additionally, concerning factors related to isolation and reclusion, pre-adult negative life experience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however, the period of isolation and reclusive life was not significant.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loneliness were identified across the types of adverse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even among young adults who share the common experience of social isolation and reclusion, heterogeneity may exist depending on their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patterns and mechanisms of isolation and reclusion are diverse.
초록
본 연구는 대상 중심 접근인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22년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모두 응답한 447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이 경험한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은 복합좌절형(131명, 29.3%), 취업좌절형(143명, 32.0%), 관계갈등형(75명, 16.8%), 저위기형(98명, 21.9%)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 및 가정 요인에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관련 약물복용 여부,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에서 유형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고립은둔 관련 요인에서는 성인기 전 부정적 생애경험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고립은둔 생활기간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외로움 모두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립은둔을 공통적으로 겪는 청년일지라도 경험적 특성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양상과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방적 접근과 개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Koh, Seongjo(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Im, Youngjae(Mokwon University) ; Kwon, Hye-young(Mokwo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09-42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09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betwee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to explore how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is, two secondary datasets―the 2023 National Survey on the Disabled (NSD) an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were integrated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A 1:1 matched dataset was established, comprising 4,149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4,149 people without disabilities, matched based on gender and age.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ere 1.746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across both groups was depressive mood (OR=11.639). High stress (OR=2.405) increased, whereas high self-rated health (OR=0.409) de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OR=12.221), stress (OR=2.295), high self-rated health (OR=0.413), being married (OR=0.704), being employed (OR=0.546), and drinking (OR=1.542). In contrast, among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ies,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OR=10.672), stress (OR=2.755), high self-rated health (OR=0.404), and equivalized income (OR=0.998).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disability-tailored mental health interventions and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particularly emphasizing employment support and initiatives to improve self-rated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통합하고 성, 연령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장애인 4,149명과 비장애인 4,149명을 1:1로 매칭하였으며, 매칭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1.7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의 독립적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우울감(OR=11.639)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스트레스(OR=2.405) 또한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높은 주관적 건강수준(OR=0.409)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우울감(OR=12.221), 스트레스(OR=2.295), 주관적 건강수준(OR=0.413), 결혼 상태(OR=0.704), 취업(OR=0.546), 음주(OR=1.542)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비장애인은 우울감(OR=10.672), 스트레스(OR=2.755), 주관적 건강수준(OR=0.404), 균등화 소득(OR=0.998)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두 자료를 통합함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주관적 건강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중재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ark, Jeonghee(National Cancer Center) ; Lim, You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28-44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28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oi, Yoon Hee(Yonsei Unversity) ; Kim, Seon Mi(Yonsei Unversity) ; Lim, Eun Hyo(Yonsei Un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48-47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48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realization gaps and social networks. We define the future realization gap as the perceived discrepancy between one’s current status and desired future aspirations. Using data from 14,966 participants aged 19 to 34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e employed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to analyze how this gap affects depression and whether social networks moderate this relationship.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sidents. Results demonstrate that larger future realization gap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depression levels in both regions. Although social networks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emerged. In metropolitan areas, social network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achievement gaps and depression. In non-metropolitan areas, social networks buffered the effects of both parental economic status gaps and individual’s educational achievement gaps on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networks serve as protective factors that mitigate the advers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perceived resource deficits. However, the mechanisms vary by reg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location-specific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adults’ ment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우울 문제를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실현에 필요한 조건과 현재 수준 간의 격차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주 연구 목적이다.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청년과 비수도권인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의 만 19세~34세 청년 14,966명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모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비수도권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와 나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자원 결핍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Lee, Sunwoo(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Haeb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75-495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75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labor market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categorizing it by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and social insurance expectation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ecarious labor experiences of new middle-aged adults. Utilizing data from the 5th to 9th waves (2014-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esearch employ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to categorize labor market trajectories.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distinct precarious labor archetypes: (1) Low-income Non-wage Workers, (2) Low-income Self-employment-oriented Workers, (3) Middle-income Self-employed Workers, (4) Low-to-middle-income Unskilled Workers, and (5) High-income Full-time Workers. Key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rajectorie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quality of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findings elucidate the dynamic labor market transitions experienced by new middle-aged individuals and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scholarly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roles of this population.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중고령에 해당되는 신중년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고, 불안정 노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5-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고소득 상용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삶의 질,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유형별 궤적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Jang, Hyekyong(Chung Ang University) ; Lee, Weonyoung(Chung 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496-517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496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primary care physicians (PCPs)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ereafter "severe disabilities") and to provide evidence for strengthening the PCP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ere drawn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total of 3,157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analyzed. Andersen’s Behavioral Model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to assess associations between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and the intention to use a PCP.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The proportion of those intending to use a PCP was 49.6%. Significant predictors included age (predisposing factor); region, healthcare service use,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experiences of difficulties due to COVID-19, health check-ups,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nabling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type of disability, need for assistance in daily living, and depressive symptoms (need factors). Notably,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merged as key factors. Direct information from welfare, administrative, or religious organizations was more effective than mass media in promoting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outreach and awareness strateg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enhance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PCP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초록
본 연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심한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시 자료 중 등록장애인 7,025명 가운데 심한 장애인 3,157명이며, Andersen 행동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인성, 가능, 필요요인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영향요인은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가 있는 비율은 49.57%(1,565명)였으며, 영향요인으로는 소인성요인에서 연령, 가능요인에서 거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건강검진 여부, 건강주치의 인지도였고, 필요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우울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와 건강주치의 인지도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정보매체 홍보보다 사회복지·행정·교육기관과 장애인단체·종교단체를 통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건강주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