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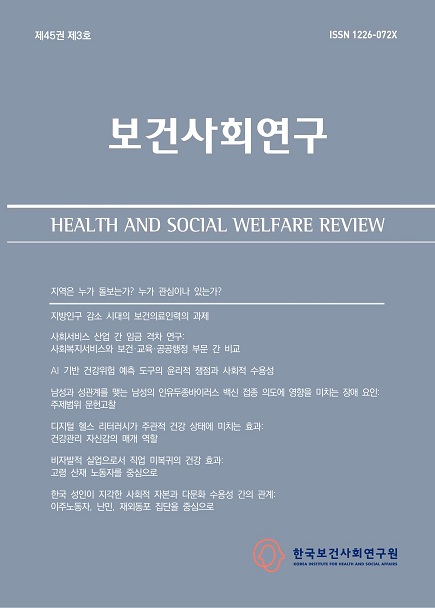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on Healthcare Expenditure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Park, Jeonghee1; Lim, Youna2*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428-447,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428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의료 수요와 비용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차의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등이 필요한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에 있어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연간 의료비는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았다. 반대로,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상용치료기관과 의사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더 낮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는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개인적·사회적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용치료원의 정책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질환과 환자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적 시행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비 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만성질환은 의료비 지출의 주요 요인이며,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진료비 110조 8,029억 원 중 약 43억 7,994만 원이 만성질환 관련 진료에 사용되었다. 특히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군으로, 2023년 관절염 환자는 5,292천 명, 진료비는 32,880억 원으로 13개 만성질환 중 2위를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만성 근골격계 질환(Chronic Musculoskeletal Discorder, CMSD)은 근육, 뼈, 관절, 결합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을 의미하며,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디스크 질환, 허리통증) 등을 포함한다(Perrot et al.,2019).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외래 이용이 잦은 특성을 보이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근골격계 질환 관련 외래 이용 건수는 총 5만 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지속적인 통증을 수반하며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Woolf & Pfleger, 2003; Dijk et al., 2008; Toye et al., 2013). 남상권과 심옥수(2011)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신체활동 제한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우울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으며, 오지현과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는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노인의 삶의 질이 100점 만점에 평균 47.94점에 불과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위해 필요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와 함께 심리적 접근과 치료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있다(Lin et al., 2020).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통증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리와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인 질환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차의료(Primary care)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일차의료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최초접촉(first contact), 지속성(longitudin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기능(coordination)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Starfield, 1994). 많은 국가에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Starfield, 1998). 그러나 한국은, 많은 국가에서 일차의료를 위한 문지기 역할(Gate Keeper)로 활용 중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접근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 일차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규식, 2014; OECD, 2012).
따라서 국내에서는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논의된 바 있다.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의 네 가지 요건을 반영한 개념으로, 환자가 질병 발생 시 또는 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방문하는 보건의료제공자(상용치료의사) 또는 의료기관(상용치료기관)을 의미한다(김두리, 2016; An et al., 2016). 상용치료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 과잉의료 방지 등 의료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연평균 의료비가 15.3% 낮고, 진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Starfield et al., 2005; Hussey et al., 2014). 특히, 근골격계 통증을 보이는 환자에게 있어 상용치료원이 제공하는 진료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데, 동일한 의료진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의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통증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21).
그러나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상용치료원 보유율은 39.4%에 불과하여, 유럽과 미국의 약 80%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상용치료원이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roke et al., 2024).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약물적 치료와 심리적 지지가 함께 요구되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상용치료원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상용치료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문헌 고찰
국내외에서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의료이용과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 임유나와 이태진(2024)의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총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Kim et al.(2019) 역시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입원 의료비가 20% 감소하고, 외래 의료비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고숙자 외(2011)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의료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Hussey et al.(2014)과 Croke et al.(2024)은 상용치료원 보유가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조기진단 등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Fullerton et al.(2018)과 Robusto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상용치료원이 응급실 이용, 재입원 등을 줄여 의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치료원이 진료의 연속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의료 만족도,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었다. 상용치료원이 있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보건의료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와 상용치료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다예, 성낙진, 2022). 또한, 이러한 소통에 있어 상용치료기관보다 상용치료의사가 더 효과적이고, 환자의 의사소통 만족도 역시 약 1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eVoe et al., 2008). Croke et al.(2024)의 연구에서도 상용치료원이 있을 경우 건강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Rothman& Wagner(2003)는 상용치료원이 치료 순응도롤 향상시키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상용치료원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Aoki et al.(2022)의 연구는 상용치료원를 보유한 환자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는 초기에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향후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Du et al.(2015)는 환자가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더 높은 품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상용치료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다른 만성질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주로 약물 치료 중심의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적인 통증 관리, 물리치료, 비약물적 중재가 주요 치료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Dijk et al., 2008; Toye et al., 2013). Croft et al.(2010)은 특히 관절염과 같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여러 의료진으로부터 단편적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증가한다고 말하며, 상용치료원을 통한 연속적인 진료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기존 국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비 절감, 환자의 만족도, 질병 예방,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상용치료원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상이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연구는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거나 대사성 질환을 위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연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외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고려하여 연간 의료비와 함께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 상용치료원 보유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기 2019, 2020, 2021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의식 및 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형평성, 접근성,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자료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20세 이상 성인 중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그림 1).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는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설문조사 중 무릎관절증, 무릎 외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추간판 장애(디스크, 척추협착증 등), 어깨관절질환(오십견, 회전근개장애, 석회화 등), 기타 척추 질환에 3년 모두 있다고 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2. 변수 정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변량, 그리고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표 1). 독립변수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이며, 한국의료패널의 상용치료원 조사 설문지에 근거하여 상용치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두 질문(상용치료기관: 귀하는 아플 때나 검사 또는 치료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단골 병의원]이 있습니까?; 상용치료의사: 주 의사 방문: 귀하는 아플 때나 검사 또는 치료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단골 의사]가 있습니까?)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 상용치료기관만 있다고 답한 경우, 상용치료 의사만 있다고 답한 경우, 그리고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 모두 있다고 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정의
| 변수 | 정의 | |
|---|---|---|
| 독립변수 |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 | 0=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 모두 미보유 1=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2= 상용치료의사만 보유 3=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 모두 보유 |
|
|
||
| 종속변수 | 연간 의료비 | 연간 의료서비스 수납금액 + 연간 약국 처방전 조제 수납금액 *연간 의료서비스 수납금액: 연간 응급서비스 수납금액+연간 입원서비스 수납금액+연간 외래서비스 수납금액 |
|
|
||
| 단위당 외래 의료비 | (연간 의료서비스 수납금액) / (연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건수) | |
|
|
||
| 통제변수 |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건수 |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건수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건수: 연간 응급서비스 이용건수+연간 입원서비스 이용건수+연간 외래서비스 이용건수 |
|
|
||
| 연령대 | 1= 20-49세 2= 50-59세 3= 60-69세 4= 70-79세 5= 80세 이상 |
|
|
|
||
| 성별 | 1= 남성 2= 여성 |
|
|
|
||
| 배우자 유무 | 0= 배우자 없음 1= 배우자 있음 |
|
|
|
||
| 교육 수준 |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 이상 |
|
|
|
||
| 장애 유무 | 1= 장애 있음 2= 장애 없음 |
|
|
|
||
| 균등화 가구 소득분위 |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5= 5분위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1= 좋음 2= 보통 3= 나쁨 |
|
|
|
||
| 의료보장형태 | 0= 건강보험 1= 의료급여 받음 |
|
|
|
||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0= 경제활동 미참여 1= 경제활동 참여 |
|
|
|
||
| 만성질환 개수 | 0= 0개 1= 1개 2 = 2개 3 = 3개 이상 |
|
종속변수는 연간 의료비와 단위당 외래 의료비로 설정하였다. 연간 의료서비스 수납금액(응급서비스,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수납금액의 합)과 연간 약국 처방전 조제 수납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단위당 외래 의료 의료비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가 주로 외래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외래서비스 수납금액을 연간 외래서 비스 이용건수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다. 두 변수 모두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갖는 비대칭 분포(right-skewed distribution)를 보여 로그 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최종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간 의료비 분석 모델에서는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건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의료이용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대,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건강 관련 특성(장애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만성질환 개수), 사회경제적 특성(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을 포함하였다. 연령대는 20세부터 49세,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균등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후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질환의 중증도를 보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찰슨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의료패널 2기 데이터에서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만성질환 개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8.0 (IBM Corp., Armonk, NY, USA)가 활용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을 적용하였다. 이는 개인 고유의 시간 불변 개체 특성(unobserved time-invariant characteristics)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괄하는 총 10개의 통제변수(연령대,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장애 유무, 균등화 가구 소득분위,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만성질환 개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본 분석에 더하여,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상용치료원 보유가 미치는 효과의 이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상용치료원 보유의 효과가 특정 인구집단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집단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를 고려한 선형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간 의료비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경우,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상용치료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보장형태×상용치료원 보유’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였다. 한편, 단위당 외래 진료비 분석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다양한 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주관적 건강상태×다유형 만성질환 보유×상용치료원 보유’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Model 1: 연간 의료비 | Model 2: 단위당 외래 의료비 | Model 3: 연간 의료비 × 의료보장형태 상호작용 | Model 4: 단위당 외래비 × 주관적 건강 × 다질환 상태
Y 1it는 개인 i의 t시점 연간 의료비, Y2it는 단위당 외래 의료비를 나타낸다. USCit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에서는 ‘상용치료원기관과 의사 모두 있음’을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두 개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포함하였다. Xit는 총 10개의 통제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αi 는 관찰되지 않는 개체별 고정효과를, ∈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MInsurit는 의료보장유형을 나타내며, Healthit는 주관적 건강상태, MCDit는 다유형 만성질환 여부를 의미한다. 다유형 만성질환자는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Multimorbidity)를 의미하며, 만성질환 개수의 범주( 0개, 1개, 2개, 3개 이상)를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음(0개), 다른 만성질환을 보유함(1개, 2개, 3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재코딩한 변수이다. 연간 의료비에서는 연간 의료이용건수를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해당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추가로, 모두 예측값(Predicted Values)와 잔차(Residuals)의 산점 행렬도(Scatter plot)을 확인하여 등분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무작위 효과(Random Effects)를 통해 독립성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 기준과 각 그룹의 인원은 아래와 같다(표 3). 전체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 7,805명 중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는 1,859명(Group A), 상용치료기관만 보유한 대상자는 1,594명(Group B), 상용치료의사만 보유한 대상자는 12명이었으며,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한 대상자는 3,620명(Group C)으로 나타났다. 상용치료의사만 보유한 경우는 표본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Group A, B, C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
(단위: 명)
| 분류 | N |
|---|---|
| 상용치료원 미보유 (Group A) | 1,859 |
|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Group B) | 1,594 |
| 상용치료의사만 보유 | 12 |
|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 (Group C) | 3,620 |
| 합계 | 7,085 |
표 3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전체 | Group A 상용치료원 미보유 (n=1,859) | Group B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n=1,594) | Group C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 (n=3,620) | |||
|---|---|---|---|---|---|---|
| 변수 | % (SE) | n (%) | n (%) | n (%) | p-value | |
| 성별 | ||||||
| 남성 | 26.7 (0.03) | 525 (28.2) | 471 (29.5) | 889 (24.6) | <.001 | |
| 여성 | 73.3 (0.02) | 1,334 (71.8) | 1,123 (70.5) | 2,731 (75.4) | ||
|
|
||||||
| 연령대 | ||||||
| 20-49세 | 2.2 (0.11) | 73 (3.9) | 29 (1.8) | 53 (1.5) | ||
| 50-59세 | 4.8 (0.07) | 135 (7.3) | 79 (5) | 125 (3.5) | ||
| 60-69세 | 17.5 (0.04) | 430 (23.1) | 257 (16.1) | 548 (15.1) | <.001 | |
| 70-79세 | 39.1 (0.02) | 693 (37.3) | 605 (38) | 1,471 (40.6) | ||
| 80세 이상 | 36.4 (0.03) | 528 (28.4) | 624 (39.1) | 1,423 (39.3) | ||
|
|
||||||
| 배우자 유무 | ||||||
| 배우자 없음 | 36.7 (0.03) | 617 (33.2) | 558 (35) | 1,423 (39.3) | <.001 | |
| 배우자 있음 | 63.3 (0.02) | 1,242 (66.8) | 1,036 (65) | 2,197 (60.7) | ||
|
|
||||||
| 교육수준 | <.001 | |||||
| 중학교 이하 | 74.1 (0.02) | 1,284 (69.1) | 1,207 (75.7) | 2,747 (75.9) | ||
| 고등학교 이하 | 18.9 (0.04) | 394 (21.2) | 283 (17.8) | 658 (18.2) | ||
| 대학교 이상 | 7.1 (0.06) | 181 (9.7) | 104 (6.5) | 215 (5.9) | ||
|
|
||||||
| 경제활동참여 상태 | ||||||
| 미참여 | 48.6 (0.02) | 760 (40.9) | 818 (51.3) | 1,857 (51.3) | <.001 | |
| 참여 | 51.4 (0.02) | 1,099 (59.1) | 776 (48.7) | 1,763 (48.7) | ||
|
|
||||||
| 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 <.001 | |||||
| 1분위 | 21.2 (0.03) | 342 (18.4) | 343 (21.5) | 816 (22.5) | ||
| 2분위 | 21.2 (0.03) | 347 (18.7) | 341 (21.4) | 811 (22.4) | ||
| 3분위 | 20.9 (0.03) | 372 (20) | 342 (21.5) | 763 (21.1) | ||
| 4분위 | 19.6 (0.04) | 415 (22.3) | 286 (17.9) | 682 (18.8) | ||
| 5분위 | 17.1 (0.04) | 383 (20.6) | 282 (17.7) | 548 (15.1) | ||
|
|
||||||
| 장애 유무 | ||||||
| 장애 있음 | 14.5 (0.04) | 203 (10.9) | 258 (16.2) | 566 (15.6) | <.001 | |
| 장애없음 | 85.5 (0.02) | 1,656 (89.1) | 1,336 (83.8) | 3,054 (84.4)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좋음 | 17.8 (0.04) | 420 (22.6) | 228 (14.3) | 609 (16.8) | <.001 | |
| 보통 | 42.6 (0.02) | 854 (45.9) | 685 (43) | 1,474 (40.7) | ||
| 나쁨 | 39.6 (0.02) | 585 (31.5) | 681 (42.7) | 1,536 (42.4) | ||
|
|
||||||
| 의료보장형태 | ||||||
| 건강보험 | 91.4 (0.02) | 1,759 (94.6) | 1,433 (89.9) | 3,275 (90.5) | <.001 | |
| 의료급여 | 8.6 (0.05) | 100 (5.4) | 161 (10.1) | 345 (9.5) | ||
|
|
||||||
| 만성질환 개수 | ||||||
| 0개 | 17.7 (0.04) | 675 (36.3) | 226 (14.2) | 352 (9.7) | ||
| 1개 | 28.2 (0.03) | 560 (30.1) | 486 (30.5) | 947 (26.2) | <.001 | |
| 2개 | 28.3 (0.03) | 365 (19.6) | 451 (28.3) | 1,185 (32.7) | ||
| 3개이상 | 25.8 (0.03) | 259 (13.9) | 431 (27) | 1,136 (31.4) |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전체 대상자(n=7,805) 중 여성은 73.3%로 남성 (26.7%)보다 많았으며, 이는 세 그룹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p<.001). 연령대는 70대와 80세 이상이 각각 39.1%, 36.4%로, 전체의 약 75%가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특히,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Group C에서 70대와 80대 이상이 약 80%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p<.001). 배우자 유무는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63.3%로 더 높았다(p<.001).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74.1%)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p<.001), 경제활동 미참여자(48.6%)와 참여자(51.4%)는 전체적으로 비슷했으나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는 Group A에서 참여율이 59.1%로 가장 높았다(p<.001). 전체 대상자의 85.5%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한 Group C에서는 ‘나쁨’이라고 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p<.001). 의료보장형태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자가 91.4%를 차지했다(p<.001).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만성질환 개수는 전체적으로 1~2개를 보유한 대상자가 56.5%를 차지하였으며, Group C에서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아, 만성질환 개수가 상용치료원 보유와 연관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p<.001).
표 4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단위당 외래 의료비 기술통계
(단위: 원)
| 상용치료원 보유 | 전체 (n=7,805) |
Group A 상용치료원 모두 미보유 |
Group B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
Group C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 |
|---|---|---|---|---|
| 연간 의료비 (원) mean (±SD) |
1,446,014 (±2,083,675) |
1,295,440 (±1,949,485) |
1,483,450 (±2,223,924) |
1,507,785 (±2,084,939) |
| 단위당 외래 의료비 (원) mean (±SD) |
25,901 (±53,034) |
33,186 (±79,105) |
25,291 (±44,310) |
22,531 (±37,775.61) |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의료비, 단위당 외래 의료비의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표 4). 연간 의료비는 Group A에서 1,295,440원, Group B가 1,483,450원, 그리고 Group C가 1,507,785원으로 상용치료원을 보유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5.03, p-value=0.002). 반면,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Group A가 33,1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Group B, Group C가 각각 25,291원, 22,531원으로 상용치료원을 모두 보유한 경우 비용이 가장 낮았다(F=24.5, p-value<.001).
3.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와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선형혼합모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연간 의료비와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고정효과 추정계수(β)에 지수 함수(exp)를 적용하여 배수로 해석였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 주변 평균(Estimated Marginal Mea ns)을 시각화하였다(그림 2, 3).
표 5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연간 의료비 (log) | 단위당 외래 의료비 (원) | ||||
|---|---|---|---|---|---|
| 변수 | exp(β) (SE) | 95% CI | exp(β) (se) | 95% CI | |
| 상용치료원 | |||||
| Group A 상용치료원 모두 미보유 | 0.854** (0.051) | 0.77 - 0.94 | 1.048 (0.047) | 0.98-1.12 | |
| Group B상용치료기관만 있음 | 0.939 (0.052) | 0.85 - 1.04 | 1.097** (0.093) | 1.03-1.17 | |
| Group C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있음 | |||||
|
|
|||||
| 성별 | |||||
| 남성 | 0.858* (0.065) | 0.75 - 0.97 | 0.896* (-0.109) | 0.82-0.97 | |
| 여성 | |||||
|
|
|||||
| 연령대 | |||||
| 20-29세 | 0.955 (0.213) | 0.63 - 1.45 | 1.806*** (0.591) | 1.37-2.38 | |
| 50-59세 | 1 (0.147) | 0.75 - 1.33 | 1.625*** (0.485) | 1.34-1.97 | |
| 60-69세 | 1.159 (0.087) | 0.98 - 1.37 | 1.524*** (0.421) | 1.36-1.7 | |
| 70-79세 | 1.098 (0.065) | 0.97 - 1.25 | 1.334*** (0.288) | 1.23-1.45 | |
| 80세 이상 | |||||
|
|
|||||
| 배우자 유무 | |||||
| 배우자 없음 | 0.937 (0.06) | 0.83 - 1.05 | 0.996 (-0.004) | 0.92-1.08 | |
| 배우자 있음 | |||||
|
|
|||||
| 교육수준 | |||||
| 중학교 이하 | 0.73** (0.121) | 0.58 - 0.93 | 0.757*** (-0.278) | 0.65-0.89 | |
| 고등학교 이하 | 0.856 (0.124) | 0.67 - 1.09 | 0.898 (-0.107) | 0.77-1.05 | |
| 대학교이상 | |||||
|
|
|||||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
| 미참여 | 1.083 (0.054) | 0.97 - 1.2 | 1.042 (0.041) | 0.97-1.12 | |
| 참여 | |||||
|
|
|||||
| 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 |||||
| 1분위 | 0.651*** (0.086) | 0.55 - 0.77 | 0.649*** (-0.432) | 0.58-0.73 | |
| 2분위 | 0.694*** (0.082) | 0.59 - 0.82 | 0.691*** (-0.369) | 0.62-0.77 | |
| 3분위 | 0.876 (0.078) | 0.75 - 1.02 | 0.812*** (-0.209) | 0.73-0.9 | |
| 4분위 | 0.885 (0.074) | 0.77 - 1.02 | 0.846*** (-0.167) | 0.77-0.93 | |
| 5분위 | |||||
|
|
|||||
| 장애 유무 | |||||
| 장애 있음 | 0.928 (0.078) | 0.8 - 1.08 | 1.006 (0.006) | 0.91-1.11 | |
| 장애 없음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좋음 | 0.75*** (0.064) | 0.66 - 0.85 | 0.905* (-0.1) | 0.83-0.98 | |
| 보통 | 0.917 (0.048) | 0.83 - 1.01 | 1.001 (0.001) | 0.94-1.06 | |
| 나쁨 | |||||
|
|
|||||
| 의료보장형태 | |||||
| 건강보험 | 10.506*** (0.102) | 8.6 - 12.84 | 4.719*** (1.551) | 4.12-5.4 | |
| 의료급여 | |||||
|
|
|||||
| 만성 근골격계 질환 제외 만성질환 개수 | |||||
| 0개 | 0.413*** (0.087) | 0.35 - 0.49 | 1.091 (0.087) | 0.97-1.22 | |
| 1개 | 0.698*** (0.071) | 0.61 - 0.8 | 0.943 (-0.059) | 0.86-1.03 | |
| 2개 | 0.839** (0.065) | 0.74 - 0.95 | 0.93 (-0.072) | 0.86-1.01 | |
| 3개이상 | |||||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는 연간 의료비(로그 변환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760, p=0.009). 상용치료기관과 의사를 모두 보유한 Group C를 기준으로,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Group A는 약 0.85배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β)=0.854, p=0.002). Group B(상용치료기관만 보유) 역시 Group C보다 더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exp(β)=0.939, p=0.23). 통제변수 중에는 의료보장형태와 만성질환 개수가 연간 의료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약 10.5배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만성질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였다. 만성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 다른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한 환자를 기준으로, 다른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 1개 있는 환자, 2개 있는 환자가 각각 약 0.4배, 0.7배, 0.8배 수준이었다.
연간 의료비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다.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Group A의 연간 의료비(로그 추정값)는 12.112(95% CI: 11.956–12.267)였으며, 차례로 Group B, Group C가 12.207(95% CI: 12.05–12.36), 12.269(95% CI: 12.12–12.41)로 나타났다.
상용치료원 보유는 단위당 외래 의료비(로그 변환값)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F=3.771, p=0.023).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Group A의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Group C보다 약 1.05배 높았으나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exp(β)=1.048, p=0.166). 상용치료기관만 보유한 Group B는 Group C 대비 약 1.1배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exp(β)=1.097, p=0.007). 분석 결과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의료보장형태였으며, 그 외에 연령대 및 균등화 가구소득 분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약 4.72배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높아졌다. 특히, 80대 이상 고령 환자에 비해 20-49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의 외래 의료비가 약 1.8배 더 높았다. 가구 소득 1분위인 환자의 의료비는 5분위에 비해 약 0.6배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당 외래 의료비의 추정값은 다음과 같다. Group A의 단위당 외래 의료비(로그 추정값)는 9.003(95% CI: 8.91-9.09), Group B는 9.005(95% CI: 8.91-9.09), Group C는 8.927(95% CI: 8.84-9.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Group B와 Group C 사이에서만 확인되었다.
4. 하위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가 고정요인(Fixed effects)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정요인과 종속변수 간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선형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간 의료비와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서 각각 Group C를 기준으로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Group B, Group A는 하위군 분석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단위당 외래 진료비는 상호작용 항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만성질환 개수를 선택하여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만성질환 개수의 범주( 0개, 1개, 2개, 3개 이상)를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음(0개), 다른 만성질환을 보유함(1개, 2개, 3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Multimorbidity)를 ‘다유형 만성질환 보유’ 변수로 재코딩하였다.
4.1.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의료보장형태는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732, p=0.009). 건강보험 가입자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Group A의 추정값은 13.328, 기관과 의사 모두를 보유한 Group C는 13.430으로,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연간 의료비가 감소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각각 10.552(Group A), 11.232(Group C)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비 추정값 자체는 낮았고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증가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표 6
의료보장형태와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 추정값
| Group A 상용치료원 미보유 |
Group C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 |
||
|---|---|---|---|
| 의료보장형태 | β (se) | β (se) | |
| 건강보험 가입자 | 13.328 (0.073) | 13.430 (0.068) | |
|
|
|||
| 의료급여 수급자 | 10.522 (0.186) | 11.232 (0.122) | |
4.2. 주관적 건강상태, 다유형 만성질환 여부에 따른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단위당 외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당 외래 진료비에 대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 여부에 따른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 3원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227, p=0.007).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면서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다유형 만성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할 때의 의료비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위당 외래 의료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
주관적 건강상태와 다유형 만성질환 여부에 따른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단위당 외래 의료비
| Group B 상용치료기관만 보유 |
Group C 상용치료기관과 의사 모두 보유 |
||
|---|---|---|---|
| 주관적 건강상태 | 다유형 만성질환 여부 | β (SE) | β (SE) |
| 좋음 | 없음 (만성 근골격계 질환만 있음) | 8.968 (0.092) | 8.846 (0.068) |
| 있음 | 9.291 (0.202) | 9.118 (0.107) | |
|
|
|||
| 보통 | 없음 (만성 근골격계 질환만 있음) | 8.935 (0.066) | 9.019 (0.056) |
| 있음 | 9.3 (0.106) | 8.98 (0.076) | |
|
|
|||
| 나쁨 | 없음 (만성 근골격계 질환만 있음) | 9.17 (0.071) | 8.979 (0.059) |
| 있음 | 9.146 (0.085) | 8.972 (0.065) | |
Ⅴ.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군은 미보유군에 비해 연간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나,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상용치료기관과 의사를 모두 보유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간 의료비 분석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때 더 높았으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상용치료원 보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단위당 외래 의료비 하위군 분석에서는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상용치료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만성 질환을 함께 지닌 환자일수록 그 효과가 다른 그룹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이용건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간 의료비가 증가한 것은, 해당 환자들이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단위비용이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총 의료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일부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질환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다. 만성 근골겨계 질환자는 고비용 영상검사 빈도가 높고, 대사성 질환에 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부족하며, 개별화된 치료와 재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예측해볼 수 있다(Nijs et al., 2024; Beiner et al., 2022).
상용치료의사를 함께 보유한 집단에서 단위당 외래 의료비가 가장 낮은 것은, 상용치료원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위당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상용치료원이 예방 차원의 의료이용,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감소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Hussey et al., 2014; Croke et al., 2024). 또한, 만성 근골격계 환자에게 상용치료 의사의 부재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더 큰 폭으로 연간 의료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취약계층 환자가 상용치료원을 보유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환자일수록 단위당 외래 의료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만성복합질환자일수록 상용치료원의 지속적 관리 및 조정 기능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201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되어 2024년 8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의 확장 가능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환자 관리의 지속성과 진료의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수립과 비대면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그 대상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로 한정되어 있고, 참여 의료기관 역시 제한적이다(보건복지부, 2024).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상용치료원 보유 환자의 단위당 외래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결과는, 일차의료 중심 관리체계가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질병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상용치료의사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상용치료원 이용에 대한 심층적인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통해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의 포괄성이나 지속성 수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권장되는 기본적인 통증 관리만으로도 상용치료원 보유는 환자의 건강 유지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Lin et al., 2020).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0-2021년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 질환이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팬데믹이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의 중증도를 조정함에 있어 만성질환의 개수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찰슨동반상병지수(CCI)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의료패널은 KCD 상병코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성질환 개수를 적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환별 중증도나 비용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한국의료패널의 설문항목을 기반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정의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의 관점에서 상용치료원을 해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상용 치료원의 형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특히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환자군에서 단위당 외래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진료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치료원 기반 관리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와 상용치료의사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이나 고비용 치료로의 전이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질환별 특성과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진료 기준(예: 검사, 처방, 방문 주기 등)을 마련하고, 일차의료기관 차원의 이용 관리 지표 도입이 병행되어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안정화를 위한 상용치료원 활용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장기추적 연구를 통해 상용치료원 보유가 전체 의료비에 미치는 구조적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개인 맞춤형 진료의 실현과 더불어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적정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상용치료원 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현재 국내 상황에서, 상용치료원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한 일차의료 강화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보건복지부. (2024).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해 보세요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 , , , , , , , , , , , & (2024). Primary health care in practice: usual source of care and health system performance across 14 countries. The Lancet Global Health. [PubMed]
, , , , , , & (2018). Impact of a usual source of care on health care use, spending, and quality among adults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Ad 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5(3), 462-471. [PubMed]
, , , , , , , , & (2020). What does best practice care for musculoskeletal pain look like? Eleven consistent recommendations from high-quali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ystema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4(2), 79-86. [PubMed]
, , , , , & (2019). The IASP classification of chronic pain for ICD-11: Chronic secondary musculoskeletal pain. Pain, 160(1), 77-82. [PubMed]
, & (2003). Chronic illness management: what is the role of primary car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8(3), 256-261. [PubMed]
(1994). Is primary care essential?. The Lancet, 344(8930), 1129-113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18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9-03

- 532Download
- 1450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