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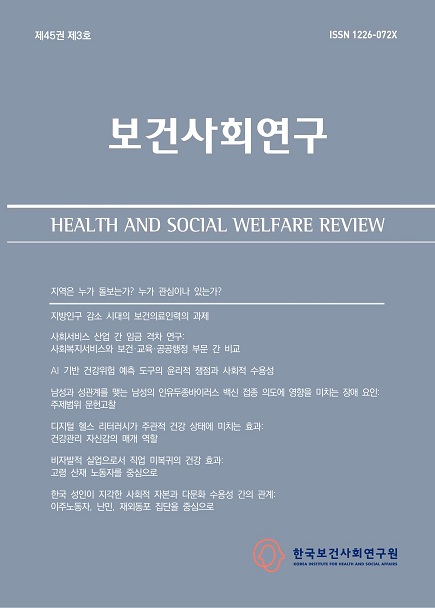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성향점수매칭분석을 활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과 그 영향요인
Suicidal Idea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etwee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oh, Seongjo1; Im, Youngjae2; Kwon, Hye-young2*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409-427,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409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기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충분히 포함한 2차자료의 부재로 두 집단의 자살생각을 직접 비교하거나 우울감 같은 주요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2차자료를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활용하여 매칭 후,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두 집단 간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우울감과 같은 공변량을 통제한 후에도 장애여부는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와 우울감 간의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결혼상태, 취업, 음주가 추가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비장애인은 균등화소득이 추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 집단에 맞춘 자살 예방 및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취업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중재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 고용의 질을 높이거나 직장 내 차별을 줄이는 등 직업유지율을 높이는 정책과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다차원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betwee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to explore how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is, two secondary datasets ―the 2023 National Survey on the Disabled (NSD) an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were integrated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A 1:1 matched dataset was established, comprising 4,149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4,149 people without disabilities, matched based on gender and age.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ere 1.746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across both groups was depressive mood (OR=11.639). High stress (OR=2.405) increased, whereas high self-rated health (OR=0.409) de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OR=12.221), stress (OR=2.295), high self-rated health (OR=0.413), being married (OR=0.704), being employed (OR=0.546), and drinking (OR=1.542). In contrast, among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ies,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OR=10.672), stress (OR=2.755), high self-rated health (OR=0.404), and equivalized income (OR=0.998).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disability-tailored mental health interventions and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particularly emphasizing employment support and initiatives to improve self-rated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통합하고 성, 연령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장애인 4,149명과 비장애인 4,149명을 1:1로 매칭하였으며, 매칭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1.7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의 독립적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우울감(OR=11.639)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스트레스(OR=2.405) 또한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높은 주관적 건강수준(OR=0.409)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비장애인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우울감(OR=12.221), 스트레스(OR=2.295), 주관적 건강수준(OR=0.413), 결혼 상태(OR=0.704), 취업(OR=0.546), 음주(OR=1.542)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비장애인은 우울감(OR=10.672), 스트레스(OR=2.755), 주관적 건강수준(OR=0.404), 균등화 소득(OR=0.998)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두 자료를 통합함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주관적 건강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중재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왔다. 자살은 사망, 자살시도 이후의 장애 등 개인적인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Klonsky et al., 2016).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11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최고치를 보여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고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 2011년 자살 예방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입안되어 자살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2022년 기준 25.2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로 차지하고 있다(OECD, 2024).
자살은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서 대표적으로 발생한다(Marlow et al., 2021). 특히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상실 및 부정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할 뿐 아니라(신유리 외, 2016; Amosun et al., 2005), 사회적 소속감의 감소(Mithen et al. 2015)나 빈곤, 소득감소 등으로 사회적 자원, 소득, 건강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박형존, 2022).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들은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며(고은혜 외, 2021; 김예순, 남영희, 2020; Choi et al. 2020; Khazem, 2018),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이 전체인구 대비 2.2배 더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2). 또한 2023년 등록장애인 인구는 2,646,922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이민경 외, 2024).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장애인의 자살 위험에 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의 작지 않은 규모와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성 및 높은 자살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자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노인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자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장애유형이나 연령대 등으로 범주화하여 장애인의 자살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불안정, 차별경험,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 또는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요인 등이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한승 외, 2024; 박로사 외, 2022; 황성혜, 임원균, 2012; 허선영, 김혜미, 2016).
더욱이 장애인 집단 내에서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2차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장애 자체가 자살 위험성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규명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 위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자살 위험을 비장애인과 비교하려는 시도는 주로 인구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사망률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망위험(Hazard ratio)이 1.38~1.9배 더 높다고 보고했다(Park et al., 2017; Lee et al., 2017; Lee et al., 2024). 또한 비장애인은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살사망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자살 위험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비장애인은 고령일수록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은 연령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거나 오히려 어린 연령일 때 자살로 인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차이가 보고되기도 한다(이유신, 김한성, 2016; Lee et al., 2017). 이들 연구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나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하여 장애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밝혀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심리사회적 변수의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우울이나 우울감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박은옥, 최수정, 2013; 이창숙, 하정화, 2024; 임소희, 2022), 우울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장애여부의 연관성이 과대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체계적 문헌고찰(Lutz & Fiske, 2018)에 따르면, 장애를 갖는 것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울이 장애와 자살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장애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arlow et al., 2021). 이는 장애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2차 자료가 부재하여 두 집단의 자살생각 위험을 직접 비교하지 못했으며,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과 같은 공변량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매칭하고, 장애 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두 집단에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자살생각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규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자살생각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1968)는 자살을 ‘자살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의한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Nock et al., 2008).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시작점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Klonsky et al., 2016). 대표적으로 Joiner(2005)가 제시한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지각된 부담감과 소속감의 좌절이 자살욕구(Suicidal desire)를 생성하고, 자살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자살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밝혔으며(이유신, 김한성, 2016; Franklin et al., 2017; Klonsky et al., 2016; Nock et al., 2008), 자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란, 2022).
2. 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은 개인적·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기존 연구들은 자살생각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며, 특히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이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자살생각을 다루는 국내외 최근 5개년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10~20대 집단이나, 양적으로 자살자가 많은 노인,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지만, 국외에서는 정신질환, 당뇨, 통증 등의 특정 질병 대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Monteith et al. 2020; Fan et al. 2024; Smith et al. 202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특정 장애유형이나 연령대로 범주를 구분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은 부정적인 신체건강과 기능상실을 경험하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 및 그에 따른 심리적인 박탈감과 경제적인 불평등을 경험한다(박형존, 2022; 신유리 외, 2016; 유동철 외, 2013; Amosun et al., 2005; Mithen et al. 2015; Tarlov & Pope, 1991). 장애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장애인의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보유, 주관적인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경험(박로사 외, 2022; 임소희, 2022), 음주 등의 건강행동(원서진, 김혜미, 2019), 차별경험과 배제, 취업여부, 소득(고은혜 외, 2021; 허선영, 김혜미, 2016), 기초생활수급(정준수, 이혜경, 2016)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 영역은 자살생각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울 또는 우울감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자살생각을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며(이은미 외, 2018; 임소희, 2022; 황성혜, 임원균, 2012), 장애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역시 자살생각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허선영, 김혜미, 2016).
한편, 장애인의 높은 자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는 것이 비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위험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대표성 있는 2차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유신과 김한성(2016)은 2014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비교 분석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2.02배[OR=2.02, 95% CI 1.476-2.764]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고연령일수록,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장애인은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고은혜 외(2021)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득, 가구소득 불만족, 경제적 갈등 등 경제적인 불안정이 중·노년기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중·노년기 장애인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유신과 김한성(2016)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고은혜 외(2021)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에서의 영향요인을 분석했을 뿐, 장애여부가 자살생각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분석하지 못했으며, 그 대상 또한 중·노년기에 한정되어 있다.
자살생각과 달리 장애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유형과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Marlow et al(2021)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각각을 보고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약 2배 이상 높으며, 장애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 인지장애, 복잡한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모두 위험이 높았지만, 청각장애는 자살생각, 이동장애는 자살계획 위험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rlow et al., 2021).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Marlow et al., 2022). Khazem & Anestis(2019)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동장애, 만성통증 등 신체장애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이 없으나,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은 약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유형이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규명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은 우울감 경험이 높아 자살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송승연, 이용표, 2021), 지적장애인은 인지적 장애로 인해 자살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Chan & Bhandarkar, 2024). 신체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가진 신체적 제약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의 제약으로 작용함을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여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또 다른 유형은 인구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사망 연구다. Lee et al(2017)와 Park et al(2017), Lee et al(2024)은 국민건강보험 샘플코호트 데이터에서 장애여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비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세 연구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Hazard ratio)이 각각 1.9배, 1.84배, 1.38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살사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자살사망률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외 심리사회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우울의 누락은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자살을 과대평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여부와 자살생각의 연관성에서 우울의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Lutz & Fiske(2018)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장애와 자살 간의 관계를 탐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으나, 우울을 통제할 경우 그러한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우울 등의 정신질환 통제 후에도 장애가 자살생각의 증가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도 존재했다(Marlow et al., 2021; McConnell et al., 2016; Russell et al., 2009). 다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장애여부는 자가 보고식 설문을 통한 기능적 장애(시력 및 청력 감소, 옷 입기, 심부름 가능 여부 등)나 신체장애 등의 여부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원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자료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매칭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먼저,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19조에 규정을 근거로 한국의 장애 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을 주기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조사이다. 조사대상자는 등록장애인 DB에 등록된 전국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읍면동, 장애인을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추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조사대상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 추출틀로 하여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 가운데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3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자료에는 <표 1>과 같은 공통설문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변수만을 추출하였고, 응답에 대해 재코딩과정을 거쳤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등 장애여부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이 부재하고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부문에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문항(“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니까?”)에서 “아니오”로 응답한 자만을 비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 집단에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방법
| 구분 | 변수명 | 측정 방법 | |
|---|---|---|---|
| 종속변수 | 자살생각 |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예=1, 아니오=0) | |
| 독립변수 | 장애요인 | 장애여부 | 장애인=1(장애인실태조사 응답자) 비장애인=0(국민건강영양조사 응답자 중 신체적·정신적 활동제한이 없는 자) |
| 인구· 사회학적 요인 | 연령 | 만 나이(19~39세=1, 40~59세=2, 60세 이상=3) | |
| 성별 | 성별(남성=1 여성=2)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1, 대졸이상=2 | ||
| 결혼상태 | 유배우자=1. 기타(미혼, 사별, 별거, 이혼 등)=2 | ||
| 1인가구 | 1인가구 여부(1인가구=1, 다인가구=0) | ||
| 경제적요인 | 균등화 소득 | 월평균가구총소득 (연속형 변수, 만 원) | |
| 경제활동 상태 | 취업 여부(취업=1, 미취업=0) | ||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예=1, 아니오=0) | ||
| 건강관련 요인 | 스트레스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거의 느끼지 않는다=1, 조금 느끼는 편이다=2, 많이느끼는 편이다=3, 대단히 많이느낀다=4) | |
| 우울감 |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예=1, 아니오=0) | ||
| 만성질환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예=1, 아니오=0) | ||
| 외래의료이용 | 최근 2주간 외래 의료기관 이용(예=1, 아니요=0) | ||
| 입원의료이용 | 최근 1년간 입원 의료기관 이용(예=1, 아니요=0) | ||
| 주관적 건강상태 |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나쁨=1, 나쁨=2, 보통=3, 좋음=4, 매우좋음=5) | ||
| 음주여부 | 최근 1년간 음주(전혀 마시지 않았다=1, 마셨다=2) | ||
| 흡연여부 | 현재 흡연자(예=1, 아니오=0) | ||
2. 연구대상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19세 이상에 해당되는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7,601명과 동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5,907명(전체 6,929명) 중 장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239명을 성, 연령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기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1:1로 매칭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매칭 결과, 등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4,149명씩 매칭되어 총 8,298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그림 1).
3. 연구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으로,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확인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살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1,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각 자료에서 자살생각을 확인하는 문항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2022.9.~2023.8.)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로 측정되어 자살생각에 대한 심각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 자료의 조사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두 자료 모두 “단순히 죽고 싶다고 푸념하는 정도의 생각을 제외한다”라는 공통된 지침을 기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자살을 위한 구체적 행동은 요하지 않으며, 심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 된다.”라는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심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를 측정하고자 하고 있어 심각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측정 문항의 차이가 분석 결과를 왜곡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두 자료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인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부를 장애인실태조사 대상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응답자로 구분한다. 장애인실태조사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엄밀히 말해 장애여부 보다는 등록장애인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건강관련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1인가구여부를 포함하였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으로 스트레스, 만성질환 여부(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주관적 건강수준, 외래 및 입원 의료기관 이용, 건강행동(흡연, 음주)를 포함하였다. 우울감 여부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공통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성향점수매칭은 실제 사회과학 연구에서 현실적, 윤리적 이유로 무작위 통제시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Rosenbaum & Rubin(1983)이 제안한 준실험적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 즉 성향점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공변량에 기반하여 추정한 뒤, 특정 집단과 유사한 성향점수를 가진 대조집단을 통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Ru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집단(7,601명)과 비장애인집단(5,239명)을 성,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자살생각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두 집단을 1:1로 매칭하여 최종 8,298명(비장애인 4,149명, 장애인 4,149명)이 선정되었다. 성향점수매칭은 Greedy 기법 및 Caliper=0.1로 시행하였다(Stuart, 2010; Rubin & Thomas, 1996). 이를 수행하기 위해 PROC PSMATCH을 활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 결과에 대한 균형진단 분석을 통해 매칭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통계량인 표준화 평균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와 분산비(variance ratio, VR)를 통해 매칭 결과를 평가하였다. 통상, SMD의 값은 0.1보다 작을 때, 분산비는 1인 경우 또는 적어도 2 이하인 경우 매칭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Austin, 2011; Stuart, 2010).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칭 후 SMD와 VR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균형있게 매칭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향점수매칭 매칭 전후 균형진단
| 변수 | 매칭 전 | 매칭 후 | ||||||
|---|---|---|---|---|---|---|---|---|
| 장애인 (N=7,601) |
비장애인 (N=5,239) |
P-value | 장애인 (N=4,149) |
비장애인 (N=4,149) |
SMD | VR | ||
| 성 | 남성 | 4,584 (60.32) |
2,299 (43.88) |
<0.0001 | 2,142 (51.63) |
2,142 (51.63) |
0.000 | 1.000 |
| 여성 | 3,016 (39.68) |
2,940 (56.12) |
2,007 (48.37) |
2,007 (48.37) |
||||
| 연령(평균, 표준편차) | 63.48 (16.29) |
52.79 (16.40) |
<0.0001 | 56.27 (15.51) |
56.27 (15.51) |
0.000 | 1.000 | |
나. 통계분석
매칭으로 추출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과 t-test 및 ANOVA를 활용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자살생각에 장애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Stepwise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고,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인구의 특성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데이터 매칭을 통해 처리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 연령은 두 집단 간 동일하게 매칭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사람의 비중이 비장애인에서는 63.5%, 장애인의 경우 80.4%로 유의하게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비장애인이 71.0%, 장애인이 45.9%로 장애인이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1인 가구의 비율은 비장애인(16.8%)보다 장애인(24.5%)이 높게 나타났다(p<0.0001). 균등화소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207.1만원 SD 137.9 vs 323.5만원 SD 213.8, p<0.0001), 취업 여부도 취업자 비중이 장애인에서는 38.0%. 비장애인에서는 59.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음주여부의 경우 무응답자비중이 높았으나, 응답자 가운데 음주비중은 장애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흡연자의 비중은 장애인에서 낮게 나타났다(p=0.0014). 의료서비스 이용은 외래와 입원 모두 장애인의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표 3
대상인구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장애인(N=4,149) | 비장애인(N=4,149) | P값 | |||
|---|---|---|---|---|---|---|
| N | % | N | % | |||
| 성 | 남성 | 2,142 | 51.6 | 2,142 | 51.6 | NS |
| 여성 | 2,007 | 48.4 | 2,007 | 48.4 | ||
| 연령(평균, 표준편차) | 56.268 | 15.508 | 56.268 | 15.508 | NS | |
| 연령군 | 19~39세 | 666 | 16.05 | 666 | 16.05 | NS |
| 40~59세 | 1,447 | 34.88 | 1,447 | 34.88 | ||
| 60세 이상 | 2,036 | 49.07 | 2,036 | 49.07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3,334 | 80.4 | 2,633 | 63.5 | <0.0001 |
| 대졸이상 | 815 | 19.6 | 1,516 | 36.5 | ||
| 결혼상태 | 유배우자 | 1,905 | 45.9 | 2,945 | 71.0 | <0.0001 |
| 기타 | 2,244 | 54.1 | 1,204 | 29.0 | ||
| 1인가구 여부 | 1인가구 | 1,016 | 24.5 | 695 | 16.8 | <0.0001 |
| 다인가구 | 3,133 | 75.5 | 3,454 | 83.2 | ||
| 균등화소득(만원) | 평균(표준편차) | 207.1 | 137.9 | 323.5 | 213.8 | <0.0001 |
| 취업여부 | 예 | 1,578 | 38.0 | 2,481 | 59.8 | <0.0001 |
| 아니오 | 2,571 | 62.0 | 1,668 | 40.2 | ||
| 기초생활수급 | 수급자 | 1,082 | 26.1 | 213 | 5.1 | <0.0001 |
| 비수급자 | 3,067 | 73.9 | 3,936 | 94.9 | ||
| 음주여부 | 예 | 1,144 | 27.6 | 2,891 | 69.7 | <0.0001 |
| 아니오 | 3,005 | 72.4 | 1,258 | 30.3 | ||
| 흡연여부 | 예 | 615 | 14.8 | 722 | 17.4 | 0.0014 |
| 아니오 | 3,534 | 85.2 | 3,427 | 82.6 | ||
| 최근 2주간 외래이용(예) | 2,441 | 58.8 | 1,070 | 25.8 | <0.0001 | |
| 최근 1년간 입원이용(예) | 668 | 16.1 | 375 | 9.0 | <0.0001 | |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비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의 비교는 <표 4>와 같다. 건강상태로는 만성질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을 파악하였다. 먼저 만성질환은 장애인의 51.1%, 비장애인의 43.3%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p<0.0001). 비장애인은 이상지질혈증(p<0.0045)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장애인은 고혈압(p<0.0001), 당뇨(p<0.000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 구분 | 장애인(N=4,149) | 비장애인(N=4,149) | P값 | |||
|---|---|---|---|---|---|---|
| N | % | N | % | |||
| 만성질환 보유 (복수 응답) | 2,118 | 51.1 | 1,798 | 43.3 | <0.0001 | |
| 고혈압 | 1,648 | 39.7 | 1,254 | 30.2 | <0.0001 | |
| 이상지질혈증 | 1,009 | 24.3 | 1,122 | 27.0 | 0.0045 | |
| 당뇨 | 913 | 22.0 | 548 | 13.2 | <0.0001 | |
| 우울감 | 577 | 13.9 | 358 | 8.6 | <0.0001 | |
| 스트레스 (평균, SD) 4점척도 | 2.205 | 0.827 | 2.051 | 0.709 | <0.0001 | |
| 주관적 건강수준 (평균, SD) 5점척도 | 2.735 | 0.915 | 3.223 | 0.836 | <0.0001 | |
최근 1년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비율은 장애인 13.9%, 비장애인 8.6%로 나타나, 장애인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 기준, 장애인은 평균 2.205(SD 0.827), 비장애인은 평균 2.051(SD 0.709)로 나타나 장애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수준(5점 척도)의 경우 장애인은 평균 2.735(SD 0.915), 비장애인은 평균 3.223(SD 0.836)으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3.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단변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25.539배[OR=25.539, 95% CI 20.926-31.168]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OR=3.577, 95% CI 2.970-4.308], 장애인[OR=3.323, 95% CI 2.707-4.079], 최근 1년간 입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OR=2.150, 95% CI 1.736-2.663], 최근 2주간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OR=1.971, 95% CI 1.651-2.353], 1인 가구인 경우[OR=1.610, 95% CI 1.325-1.9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수준, 음주, 기혼자, 취업, 높은 주관적 건강수준이 자살생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장애여부와 통제변수의 영향을 단계적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감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12.221배[OR=12.221, 95% CI 9.456-15.795], 비장애인의 경우는 10.672배 [OR=10.672, 95% CI 6.939-16.413] 더 많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장애인은 2.295배 [OR=2.295, 95% CI 1.941-2.715], 비장애인은 2.755배[OR=2.755, 95% CI 2.105-3.607] 더 많이 자살생각을 하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장애인 집단에서는 0.413배[OR=0.413 95% CI 0.266-0.644], 비장애인집단은 0.404배[OR=0.404, 95% CI 0.220-0.740] 자살생각을 적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장애인에서는 유배우자[OR=0.704, 95% CI 0.545-0.910], 취업자[OR=0.546, 95% CI 0.398-0.748], 음주[OR=1.542, 95% CI 1.145-2.078]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비장애인은 균등화 소득[OR=0.998 95% CI 0.997-0.999]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살생각에 관한 단계적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Stepwise selection)
| 변수 | 장애인 | 비장애인 | 전체 | ||||
|---|---|---|---|---|---|---|---|
| OR | 95% CI | OR | 95% CI | OR | 95% CI | ||
| Intercept | 0.005 | [0.003-0.007] | 0.002 | [0.001-0.005] | 0.004 | [0.003-0.006] | |
| 우울감 | 예 | 12.221 | [9.456-15.795] | 10.672 | [6.939-16.413] | 11.639 | [9.342-14.501] |
| (Ref=아니오) | 1 | - | 1 | - | 1 | - | |
| 스트레스 (4점 리커트) | 2.295 | [1.941-2.715] | 2.755 | [2.105-3.607] | 2.405 | [2.084-2.774] | |
| 주관적 건강수준 | 좋음 | 0.413 | [0.266-0.644] | 0.404 | [0.220-0.740] | 0.409 | [0.286-0.583] |
| 보통 | 0.532 | [0.397-0.714] | 0.685 | [0.437-1.072] | 0.599 | [0.470-0.764] | |
| (Ref=나쁨) | 1 | - | 1 | - | 1 | - | |
| 결혼상태 | 유배우자 | 0.704 | [0.545-0.910] | 0.793 | [0.636-0.990] | ||
| (Ref=미혼, 사별, 별거) | 1 | - | 1 | - | |||
| 취업 | 예 | 0.546 | [0.398-0.748] | 0.684 | [0.532-0.880] | ||
| (Ref=아니오) | 1 | - | 1 | - | |||
| 음주 | 예 | 1.542 | [1.145-2.078] | ||||
| (Ref=아니오) | 1 | - | |||||
| 균등화 소득(만 원) | 0.998 | [0.997-0.999] | 0.999 | [0.998-1.000] | |||
| 현재 흡연 | 예 | 1.476 | [1.126-1.935] | ||||
| (Ref=아니오) | 1 | - | |||||
| 장애여부 | 장애인 | 1.746 | [1.341-2.273] | ||||
| (Ref=비장애인) | 1 | - | |||||
| -2 Log L | 1758.209 | 769.904 | 2,535.378 | ||||
| Nagelkerke R2 | 0.4227 | 0.3283 | 0.415 | ||||
연구대상집단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감[OR=11.639, 95% CI 9.342-14.501]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감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1.639배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함께 높은 스트레스[OR=2.405, 95% CI 2.084-2.774]와 현재 흡연[OR=1.476, 95% CI 1.126-1.935]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취업[OR=0.684, 95% CI 0.532-0.880]과 높은 주관적 건강수준[OR=0.409, 95% CI 0.286-0.583]은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였던 장애여부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살생각의 오즈비를 1.746 배[95% CI 1.341-2.273]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교호작용을 고려하여 하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여부와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p=0.9481)을 보이지 않았다. 또, 스트레스와 장애여부(p=0.1407), 주관적 건강수준과 장애여부(p=0.4264)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장애여부가 우울감 경험 여부,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 정도와 무관하게 자살생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감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에서 장애여부는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1.710배 [95% CI 1.583-1.847]로 우울감이 없는 집단에서의 1.723배[95% CI 1.580-1.878]와 유사한 수준이다. 즉 장애 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감 경험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우울감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Unadjusted)
| 변수 | 우울감 유경험자 | 우울감 무경험자 | |||
|---|---|---|---|---|---|
| OR | 95% CI | OR | 95% CI | ||
| Intercept | 0.551 | [0.511-0.595] | 0.023 | [0.021-0.025] | |
| 장애여부 | 예 | 1.710 | [1.583-1.847] | 1.723 | [1.580-1.878] |
| (Ref=아니오) | 1 | - | 1 | - | |
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분석하고 그 영향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해 「2023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2023년)」 자료(장애경험응답자 제외)를 매칭한 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여부는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1.746배[OR=1.746, 95% CI 1.341-2.27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다고 언급한 기존 연구(이유신, 김한성, 2016; Marlow et al., 2021; Lee et al., 2017; Lee et al., 2024; Park et al., 2017)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서로 다른 두 자료를 통합한 본 연구와 달리 2014년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비교한 이유신과 김한성(2016)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통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2.02배[OR=2.02, 95% CI 1.476-2.764] 높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그들은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우울감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않아 누락변수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가 존재한다, 우울 통제 후에도 여전히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Marlow et al(2021)와 McConnell et al(2016)와 Russell et al(2009) 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 경험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여부가 여전히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장애여부와의 교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 중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OR=11.639, 95% CI 9.342-14.501],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박은옥, 최수정, 2013; 이은미 외, 2018; 임정미, 김지훈, 2024; Park et al., 2014).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에서도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감의 영향은 가장 컸으며, 비장애인[OR=10.672, 95% CI 6.939-16.413]보다 장애인[OR=12.221, 95% CI 9.456-15.795]에서 우울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서원선 외, 2019; Khazem, 2018)에 따르면, 장애여부 자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우울이나 차별 등의 다른 변수를 통한 매개경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장애여부와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 살펴본 결과, 우울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수준은 두 집단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이에 더해 결혼상태, 취업, 음주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장애인은 추가로 균등화 소득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등화 소득이 중·노년기 장애인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중·노년기 비장애인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고은혜 외(2021)의 연구와 비슷하다. 반면 취업이 장애인에게만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장애인의 취업이 사회참여로 이어져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의미를 지니므로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낮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원서진, 김혜미, 2019; 이유신, 김한성, 2016).
그 외 전체 집단에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김민경, 조경원, 2019; 윤명숙, 김새봄, 2020; 임소희, 2022; 원서진, 김혜미, 2019; 이은미 외, 2018).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살생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지은 외, 2024; 박은옥, 최수정, 2013). 결혼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임정미, 김지훈, 2024),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러한 고립감을 감소하고 이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서원선 외, 2019; 임소희, 2022).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두 자료를 결합하여 구축한 자료의 비교가능성의 문제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전국단위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방법과 조사문항의 차이가 있음에도 두 자료를 결합 및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매칭하여 비교하였다. 예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애인실태조사와 자기기입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음주 및 흡연 등의 건강행태 변수, 의료이용,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 변수 등 일부 문항) 간의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두 집단 간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나타난 각 자료의 심각성의 차이는 두 자료의 조사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문항의 뉘앙스로 인한 응답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장애인의 자살생각을 상대적으로 과잉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결과해석 시 주의를 요구한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원인 장애인 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연구로 장애에 따른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후관계나 인과성을 고려할 수 없기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비장애인 집단을 추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장애 여부에 대한 설문문항이 등록장애인여부를 묻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이 아닌, 활동제한경험 여부로 확인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추출한 비장애인 집단에 장애인이 일부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차이 및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자살생각, 자살시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종단연구나 매개, 조절분석을 통해 장애 유형별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의 전환 과정이 어떠한 맥락으로 진행되는지 밝히는 것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매칭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우울감 등 공변량을 통제한 후 장애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살위험 및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중재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살생각을 낮추는 긍정요인으로 확인된 취업과 주관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63.3%) 의 절반 수준인 37.2%에 불과(이민경 외, 2024)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외에 고용의 질 제고나 직장내 차별 감소 등 직업 유지율을 높이는 지원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취업은 자살생각에 주요 변수인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차은아, 임성옥, 2013), 우울감은 실업의 원인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황주희 외, 2014), 더불어, 주관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건강문제 전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개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질적 자료의 통합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두 포함된 건강, 영양, 의료 이용 그리고 삶의 질이 모두 포함된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대한 정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2023).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 2025. 2. 1.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
, , & (2005). Health promotion needs of physically disabled individuals with lower limb amputation in Rwanda.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7(14), 837-847. [PubMed]
, , & (2020).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risk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3, 9-14. [PubMed]
, , , , , , & (2024). Suicide dea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in patients with diabet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80(10), 4050-4073. [PubMed]
, , , , , , , , , & (2017). Risk factors f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 meta-analysis of 50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3(2), 187. [PubMed]
(2018). Physical disability and suicide: recent advancements in understanding and future directions for considerat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2, 18-22. [PubMed]
, & (2019). Do physical disabilities differentiate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n examination within the lens of the ideation to action framework of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4), 681-695. [PubMed]
, , & (2016). Suicide,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2(1), 307-330. [PubMed]
, , , & (2024).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disability and suicide mortality in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53(6), dyae163. [PubMed]
, , , , , & (2017).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suicide risks in South Korea: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ata from 2003 to 2013.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0(1), 123-130. [PubMed]
, & (2018). Functional disability and suicidal behavior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 systematic critical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7, 260-271. [PubMed]
, , , , & (2021). Association between disability and suicide-related outcomes among US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61(6), 852-862. [PubMed]
, , , , & (2016). Suicidal ideation among adults with disability in Western Canada: a brief report.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2, 519-526. [PubMed]
, , , & (2015). Inequalities in social capital and health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26, 26-35. [PubMed]
, , , , , , & (2020).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female veterans: Prevalence, timing, and onse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3, 350-357. [PubMed]
OECD. (2024, December 23). Suicide rates.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suicide-rates.html
, , , , , , & (2014).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older individuals receiving home‐car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9(4), 367-376. [PubMed]
, , , & (2017). Disparities in mortality by disability: an 11-year follow-up study of 1 million individ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2, 989-996. [PubMed]
, & (1996). Matching using estimated propensity scores: relating theory to practice. Biometrics, 52, 249-264. [PubMed]
, , & (2009). Physical Disability and Suicidal Ideation: A Community-Based Study of Risk/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Thoughts. Suicide & Life - Threatening Behavior, 39(4), 440-51. [PubMed]
, , , , , , , , , , & (2023). The association of pain wi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aged ≥50 years from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8(7).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2-14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8-1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8-28

- 358Download
- 690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