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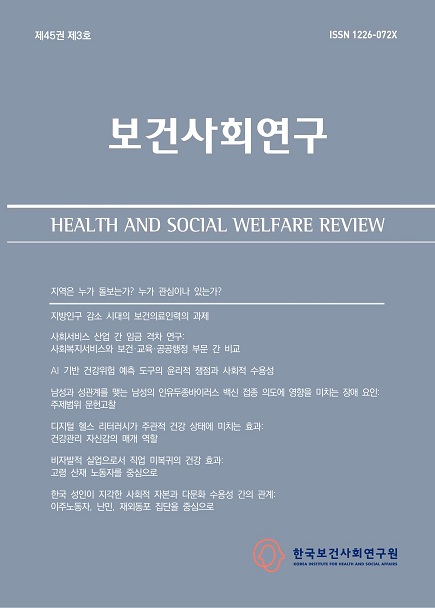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노인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강도의 영향 요인 연구: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적용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lder Adults’ Participation in and Frequency of Volunteering: An Analysis Using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Kang, Chulhee1; Choi, Seong Eo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147-167,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14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 자료의 속성, 즉 과도한 0값(zero inflation)의 문제를 해소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분석하면서, 적합한 분석 방법의 선택에 따라 동일 모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았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첫째, 영포화 음이항 모형은 일반 모형보다 0값의 구조를 잘 반영해 분석 타당성이 높았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는 동일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결정 요인을 가지는 이중 구조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과 지속적 활동을 위한 전략은 분리되어야 한다. 관계망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참여 지속이 중요하다. 또한 참여 구조가 복합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자료의 분포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향후에는 종단자료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in contributing to the public good but also in enhancing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fostering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the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remains at a relatively low level. To promote wide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buil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among older adult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mpares the results of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those of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pplying an analytical method that reflects the data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ndard Negative Binomial model fails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excess zero values— representing non-participation—which may lead to inaccurate estima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In contrast,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hich is better suited to data with an excessive number of zeros, yields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Specifically, only educational attainment (positive), housing status (renter), depressive symptoms (negative), and institutional trust (negativ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sity of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in the zero-inflated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achie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lder adults’ volunteer behavior, it is crucial to apply analytical approaches that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study underscores that the appropriate choice and application of statistical models are essential tasks in the knowledge-building process.
초록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상에 대한 이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자료 속성에 맞춘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반 음이항 회귀모형은 과도하게 분포된 0값,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명 변수의 영향력이 정교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경향을 가졌다. 반면, 과도한 0값이 다수 분포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모형은 음이항 회귀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거주형태(임차가구), 우울감(-), 제도신뢰(-)만이 노인 자원봉사 참여 강도를 설명하는 변수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지식의 구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과제란 사실을 제시해준다.
Ⅰ. 서론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공영역의 개입만으로 모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영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균형적 노력의 차원에서 비영리 영역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더불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주제이다(이용관, 2015). 다양한 인구집단의 자원봉사 활동 중 신체적인 제한성으로 인해 참여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소중하게 평가받는 주제가 바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이기에, 이에 대한 이해의 축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기여한다. Okun(1994)은 자원 봉사가 생산적인 활동으로서 기능하며, 인정 욕구 충족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Rowe 와 Kahn(1997) 또한 성공적 노화 이론의 시각에서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내 유대감 형성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원의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김여진, 2013).
그러나 이러한 다층적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인구 중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356,478명(행정안전부, 2024)으로 이 연령대에 속한 인구(약 천만 명 이상) 대비 매우 소수이다. 비록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신체적 혹은 환경적 제약 속에 있긴 하나,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이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실증적 분석을 요구한다.
실증적 분석의 과정에서 대다수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적 접근이 고려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참여 횟수’로 측정되어지는 상황에서,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또는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이현기, 2013; 송기영, 김욱진, 2017).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노인 집단에서, 즉 0값이 과도하게 분포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봉사 ‘참여 여부’ 또는 ‘참여 강도’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료의 속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석해 온 경향성을 갖는다(이현기, 2011; 김여진, 2013; 이주영, 2020; Shantz et al., 2014; Sanchez-Garcia et al., 2022; Serrat et al., 2023). 사실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는 서로 다른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기에(Wilson, 2012), 통합적인 분석 틀 속에서 두 과정을 구분하며 분석해 내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예로, 참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참여 강도만을 분석할 경우, 비참여자가 분석에 서 배제되어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제한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 집단을 간과해 버리는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다.
과도한 0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의 이질적인 참여 속성이란 특성을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분석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분포 특성과 구조적 이질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분석모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그 결과가 일반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 결과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가 현격하게 작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분석하는 데보다 적절한 분석방법으로서 자원봉사 ‘참여 여부’(0 또는 1)와 ‘참여 강도’(횟수)를 동시에 고려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이중 구조적 속성을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분석모형의 비교를 통해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현상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과연 어떤 분석 틀이 보다 유용한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도 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을 위해 과연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다 적합한 분석방법을 통해 제시되는 결과가 제시해주는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의 틀
노인의 자원봉사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Musick과 Wilson(2007)이 제시한 자원봉사 사회 프로파일 모형(Volunteer Social Profil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자원봉사 동기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의 접근이나 환경 및 제도적 영향력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의 접근과는 달리, 자원봉사 행동을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현되는 행위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원, 사회적 상황, 주관적 성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합적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첫째, 인적자원은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개인적 자산(assets)을 의미하는 데, Musick과 Wilson(2007)은 자원봉사 행동에 있어 개인이 보유한 자원(resources)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로 그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경제적 수준(소득, 소비), 건강 상태, 계층 등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적 상황은 자원봉사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Musick과 Wilson(2007)은 자원봉사 활동은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이나 국가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로 사회적 관계망(단체 참여, 인적 관계망), 이웃 및 거주지역, 학교와 종교적 장 등을 제시한다.
셋째, 주관적 성향은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특성, 동기, 태도, 규범, 가치 등의 심리적 속성을 의미하는데, Musick과 Wilson(2007)은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성향과 자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종교성, 가치와 규범 등을 제시한다.
정리하면, Musick과 Wilson이 제시하는 분석틀은 자원봉사 행동의 이해를 위해 단일 차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지양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즉 이 분석틀은 자원봉사 행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요인에 기반해서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참여 강도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방식과 부합한다.
2. 인적자원 요인(Individual Resources)에 대한 선행 연구
인적자원 요인에 속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경제적 수준(소득·소비), 건강 상태 등의 변수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Wilson(2012)은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의 자원봉사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 시간이 많고 친사회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한다(임동진, 채성준, 2014; 양지훈, 서종수, 2019; 이삼식, 최효진, 2019; Griffin & Hesketh, 2008; Johnson et al., 2018; Serrat et al., 2023). 또한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 강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한다(이현기, 2013; 강철희 외, 2017; Zettel-Watson & Britton, 2008). 이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참여율과 참여 강도에 있어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Musick과 Wilson(2007)은 연령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가능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양지훈, 서종수, 2019; 이삼식, 최효진, 2019; 남혜진 외, 2021; Kim et al., 2007; Johnson et al., 2018; Sung et al., 2023; Han et al., 2023; Serrat et al., 2023). 그러나 자원봉사참여의 강도와 관련해서는 연구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Einolf(2011)은 OLS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증가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반면,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한 이현기(2013)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연령 증가에 따라 자원봉사참여 강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Hendricks & Cutler(2004)는 자원봉사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참여 강도가 증가하다가, 노년기 이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령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의 증가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을 갖지만,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는 연령의 부적인 영향력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Musick과 Wilson(2007)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식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능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이현기, 2012; 김여진, 2013; 김명숙, 고종욱, 2014; 임동진, 채성준, 2014; 양지훈, 서종수, 2019; 김희영, 2021; 남혜진 외, 2021; Kim et al., 2007; Griffin & Hesketh, 2008; Johnson et al., 2018; Sanchez-Garcia, 2022; Sung et al., 2023; Han et al., 2023; Serrat et al., 2023). 또한, 자원봉사참여 강도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참여 강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한다(이현기, 2013; 강철희 외, 2017; Zettel-Watson & Britton, 2008; Einolf, 2011).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넷째, Musick과 Wilson(2007)은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유급 노동과 자원봉사 활동이 시간적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충돌할 수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자원봉사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남혜진 외, 2021; Johnson et al., 2018; Han et al., 2023). 한편, 자원봉사참여 강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더 낮다는 결과도 있다(이현기, 2012, 2013). 종합해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나, 참여 강도 측면에서는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Musick과 Wilson(2007)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자본도 보유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관련해서,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다(김명숙, 고종욱, 2014; 이삼식, 최효진, 2019; Johnson et al., 2018; Sanchez-Garcia et al., 2022; Han et al., 2023; Serrat et al., 2023). 그러나 자원봉사참여의 강도와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제시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나(남을순, 이윤석, 2021; Einolf, 2011),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강도가 낮다고 보고하기도 한다(이현기, 2012, 2013; 강철희 외, 2017; Zettel-Watson & Britton, 2008). 종합해 보면, 높은 경제적 수준은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는 정적 방향의 영향력을 일반화시키기는 제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usick과 Wilson(2007)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고 사실을 제시하면서, 건강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고한다(이현기, 2012; 김명숙, 고종욱, 2014; 이삼식, 최효진, 2019; 김희영, 2021; Kim et al., 2007; Johnson et al., 2018; Sung et al., 2023; Han et al., 2023; Serrat et al., 2023). 더 나아가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참여 강도가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된다(이현기, 2011, 2012; 강철희 외, 2017; 남을순, 이윤석, 2021; Wilson & Musick, 1997).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건강수준이 높은 노인의 참여율과 참여 강도는 일관적으로 보다 높은 경향성, 즉 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3. 사회적 상황 요인(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 요인에 속한 사회적 관계망,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의 변수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Musick과 Wilson(2007)은 사회적 관계망이 클수록 자원봉사 기회를 접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관련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커지는 경향성이 존재하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고된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클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다(이현기, 2012; 김여진, 2013; 김명숙, 고종욱, 2014; 김희영, 2021; Serrat et al., 2023).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참여 강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한다(이현기, 2012, 2013; 강철희 외, 2017).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참여율과 참여 강도에의 영향력은 일관적인 경향이 있다.
둘째, Musick과 Wilson(2007)은 거주 지역과 관련하여, 도시 지역보다 교외 지역에서 동질적 사회관계망이 형성되고 지역 기반 활동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과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제시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도시 외의 지역(읍·면·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더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갖는다고 보고하나(Kim et al., 2007), 다른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김명숙, 고종욱, 2014),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다.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강도가 높다는 결과(남을순, 이윤석, 2021)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강도가 높다는 결과(이현기, 2013)가 공존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와 참여 강도에 거주 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Musick과 Wilson(2007)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해서 자가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임차인보다 지역 사회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사회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 정적인 관계를 제시한다(Kim et al., 2007). 아직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의 자원봉사 참여 강도에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으나,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가 거주자가 자원봉사 참여 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송기영, 김욱진, 2017; 이수영, 정의철, 2021; DiPasquale & Glaeser, 1999).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자가 거주자의 참여율과 참여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4. 주관적 성향 요인(Subjective Dispositions)
주관적 성향 요인에 속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종교 활동 참여 강도, 지역사회 만족도, 신뢰 등의 변수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Musick과 Wilson(2007)은 개인의 성격 특성 중 더 뛰어난 감정 조절과 긍정적 정서로 대표되는 외향성과 친근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우울 성향이 클수록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클수록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다(Johnson et al., 2018).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우울감이 클수록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일관되게 제시한다(Zettel-Watson & Britton, 2008).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우울감은 노인의 참여율과 참여 강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둘째, Musick과 Wilson(2007)은 행복감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듯이, 행복한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 사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김여진, 2013; 김명숙, 고종욱, 2014; 양지훈, 서종수, 2019).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된다(Bjälkebring et al., 2021).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참여율과 참여 강도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셋째, Musick과 Wilson(2007)은 종교적 신념과 태도 및 정서가 자원봉사 동기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타인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종교적인 경험이 자원봉사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종교 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고한다(이현기, 2012; 김여진, 2013; 김명숙, 고종욱, 2014; 임동진, 채성준, 2014; 이삼식, 최효진, 2019; Kim et al., 2007; Johnson et al., 2018; Han et al., 2023).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는 혼재된 결과가 제시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원봉사 참여 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강철희 외, 2017; Einolf, 2011), 다른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이 강할수록 자원봉사참여 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한다(이현기, 2012, 2013). 종합해 보면, 종교 활동 참여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경향성이 있으나,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력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Musick과 Wilson(2007)은 자원봉사 활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활동인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니는 지역사회 애착과 유대감이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와 참여 강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제시한다(신지연, 박인권, 2021; Rotolo et al., 2010).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추해 보면,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지역사회 만족도와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참여 강도의 관계는 정적 관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usick과 Wilson(2007)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협력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의 경향성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관계에 대해 노인 대상의 실증적 분석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다(강철희, 2007). 자원봉사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노인은 참여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다(Einolf, 2011). 한편, 신뢰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된다.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내집단 신뢰가 높은 경우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과 빈도가 모두 낮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보고한다(이종화, 정진경, 2022). 종합해 보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신뢰의 영향력이 존재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와 같이 다양하게 구분하면서 그 관계들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정리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강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일부 변수는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으나, 다른 변수와 관련해서는 지속적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향후 노인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대표성 있는 자료에 기반한 연구, 보다 엄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노인 자원봉사 참여와 강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연구,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면서 그 관계를 비교의 차원에서 보다 엄밀하게 검증해 내는 연구를 진행하며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 및 심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2023 노인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는 한국의 노인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조사는 제6차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2023년 9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일반 주거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층화추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6차 노인실태조사 자료(2023)를 활용한다. 총 응답자가 10,078명이었는데, 이중 대리 응답 사례를 제외한 9,95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빈도이다. 자원봉사 참여에서는 이전 연도의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 여부를 측정하고, 자원봉사 참여 빈도는 월평균 자원봉사 참여의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원봉사 참여와 참여 횟수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인적 자원요인, 사회적 상황 요인, 주관적 성향요인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요인에 속한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경제활동 상태, 경제적 수준(소득, 소비), 건강 상태를 포괄시켰는데, 성별의 경우 남성을 0, 여성을 1로 설정하고, 연령은 조사 시점의 만 나이 측정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육 수준의 경우, 각 노인의 교육연수로 측정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0, 하는 경우를 1로 설정해서 분석에 활용한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가구소득과 함께 소비수준도 같이 활용하여 경제적 수준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했는데, 가구소득은 연 가구소득의 합산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가구 소비는 월평균 가구 소비액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의 건강 상태에 대한 5점 척도 방식의 측정으로 이뤄졌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회적 상황 요인에는 사회적 관계망(단체참여, 인적 관계망), 거주지역, 주택 소유 변수를 포괄하였다. 단체 참여는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주당 이용 횟수를 합산하여 사용하고. 인적 관계망은 노인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수(친구, 이웃, 지인)를 합산하여 사용하는데, 첨도 값이 10을 넘어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거주지역은 읍면이 0, 동을 1로 설정해서 사용한다. 주택 소유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거주로 측정된 문항에서 자가를 0, 그 외 전세, 월세, 무상 거주는 1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세 번째, 주관적 성향요인에는 우울감, 삶의 만족도, 종교 생활 참여, 지역사회 만족도 변수를 포괄하였다. 우울감은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가 사용되었는데, 여부(0, 1)로 측정한 15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우울의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여가문화 활동’, ‘친구·지역사회 관계’,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데, 점수가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며,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9로 나타났다. 종교 생활 참여는 종교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원래의 조사에서 무종교, 종교는 있으나 무참여, 월 1회 미만 참여, 월 1회 참여, 월 2~3회 참여, 주 1회 참여, 주 2~3회 참여, 주 4회 이상 참여와 같이 서열 변수의 형태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지역사회만족도는 ‘상업 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 빈도/노선’, ‘공원·녹지공간’, ‘치안, 교통 안전’, ‘이웃과의 교류 기회’,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합산하여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9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원래의 자료에서 가족·지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언론· 기업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속한 항목을 합산하여 내집단 신뢰로 그리고 후자에 속한 항목을 합산하여 제도 신뢰로 설정해서 사용한다. 제도 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801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내집단 신뢰는 .50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집단 신뢰의 경우 문항 수가 두 개인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항 수가 적을수록 신뢰도 계수는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계수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측정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Eisinga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관계 범주에 대한 신뢰 수준을 포착함으로써, 관계 기반의 신뢰 성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하였다.
3. 분석 방법
행정안전부 보고(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의 시민 중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356,478명으로 참여 인구의 비중은 매우 낮다. 본 연구 분석대상 9,951명 중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자는 237명(2.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에서 과도한 영값(zero inflation)을 나타냈고, 자원봉사 참여 횟수의 경우, 그 평균은 0.06회이고 분산은 0.384로 평균보다 분산이 큰 전형적인 과대산포(overdispersion) 구조를 나타냈다.
자원봉사참여 횟수와 같은 형태의 가산 변수(count variable)가 종속변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이 사용되는데, 포아송 회귀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따르기에, 과대산포를 보이는 경우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Hilbe, 2011). 이런 상황에서 음이항 회귀분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 이유는 음이항 회귀분석은 포아송 분포의 확률모형을 확장하여, 분산이 평균보다 클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과대산포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Cameron & Trivedi, 1986). 이렇게 음이항 회귀모형1)은 과대산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하나, 0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zero-inflation)에는 적절하지 않다. 음이항 회귀모형에서는 모든 0을 단순한 가산형 변수의 일부로 간주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Lambert, 1992)에 반해, 현실의 자원봉사에서 비참여(0의 값)는 두 가지 다른 과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적 비참여(structural zero)로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우연적 비참여(random zero)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만 특정 시점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Lambert, 1992). 즉 우연적 비참여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나 일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를 포괄한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 비참여와 우연적 비참여를 구분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두 가지 다른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참여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석 방법이다(Lambert, 1992). 이런 속성을 반영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관측값이 항상 0이 되는 구조적 과정으로 로지스틱 회귀로 구성되는 영포화 모형(Zero-Inflation Model)이고, 두 번째 단계는 구조적으로 0이 아닌 그룹(즉, 0이 나올 수도 있고, 1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음이항 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가정하여 횟수 값을 설명하는 횟수형 모형(Count Model)이다.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영포화 과정은 수식 (1)과 같다. 여기서 πi는 구조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며, (1-πi)은 자원봉사가 가능한 집단의 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θ/(θ+μi))θ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식에 기반하여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Lambert, 1992).
| 수식 (1) 1단계 영포화 모형을 통한 확률분포 |
|
이후 두 번째인 횟수형 모형에서 영포화 확률을 고려한 음이항 회귀 과정은 수식 (2)과 같다. 여기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의 과정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집단의 확률인 (1-πi)를 추가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y>0)으로만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단순히 과대산포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0을 걸러내고,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잠재적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음이항 회귀분석보다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 수식 (2) 2단계 횟수형 모형 : 영포화 확률을 고려한 음이항 회귀분석의 과정 |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값과의 비교 차원에서 음이항 회귀분석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관련해서는 R의 tidyverse 패키지를 활용하고, 음이항 회귀분석은 MASS 패키지,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pscl 패키지를 활용한다. 또한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 비교를 위해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pscl 패키지의 Vuong‘s 검정을 실시한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의 자원봉사 활동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대상 자원봉사 활동의 분포는 <표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분석대상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9,714명(97.6%), 참여하는 노인이 237명(2.4%)이었다. 소수의 노인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빈도를 보면, 분석 대상 모두의 자원봉사 참여 빈도는 평균 월 0.06회(SD=.62)였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 참여 빈도는 평균 월 2.67회(SD=3.00)였다.
표 1
분석대상의 자원봉사 활동 특성
(n=9,951)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 자원봉사참여 | 안 함 | 9,714 | 97.6 | |||
| 함 | 237 | 2.4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자원봉사빈도 | .06 | .62 | 0 | 20 | ||
| 노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빈도(n=237) | 2.67 | 3.00 | 1 | 20 | ||
본 연구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인적자원 요인에 속한 각 변수의 빈도 및 평균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이 6,127명(61.6%)으로 남성 노인 3,824명(38.4%)이었다. 현재 근로 여부를 보면, 일하지 않는 노인이 6,009명(60.4%), 현재 일하는 노인이 3,942명(39.6%)이었다. 연령의 경우 평균 74.02세(SD=6.75)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평균 8.24년(SD=4.24)으로 중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구 소득은 평균 3,259만 원(SD=3,423.72)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6,762만 원)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월평균 가구 소비의 경우에는 평균 151만 원(SD=112)으로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비(283만 원)의 절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통계청, 2024). 단일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 수준은 평균 3.17점(SD=0.89)이었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9,951)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인적자원 | 성별 | 남성 | 3,824 | 38.4 | 사회적 상황 | 지역 | 읍면 | 2,974 | 29.9 |
| 여성 | 6,127 | 61.6 | 동부 | 6,977 | 70.1 | ||||
| 근로 | 안 함 | 6,009 | 60.4 | 거주형태 | 자가 | 7,994 | 80.3 | ||
| 함 | 3,942 | 39.6 | 임차 | 1,957 | 19.7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왜도 | 첨도 | |||
| 인적자원 | 연령 | 74.02 | 6.75 | 65 | 103 | .579 | -.449 | ||
| 교육연수 | 8.24 | 4.24 | 0 | 22 | -.341 | -.349 | |||
| 가구 소득 | 3,259.02 | 3,423.72 | 0 | 84,896 | 5.392 | 70.542 | |||
| 가구 지출 | 151 | 112 | 4 | 2,000 | 4.053 | 37.936 | |||
| 주관적 건강 | 3.17 | .89 | 1 | 5 | -.375 | -.580 | |||
| 사회적 상황 | 단체 참여 | 1.19 | 2.02 | 0 | 30 | 2.148 | 8.044 | ||
| 인적 관계망 | 3.46 | 2.75 | 0 | 50 | 2.973 | 22.799 | |||
| 주관적 성향 | 우울감 | 3.09 | 3.24 | 0 | 15 | .782 | 2.460 | ||
| 삶의 만족도 | 16.17 | 2.94 | 5 | 25 | -.335 | .114 | |||
| 종교생활참여 | 1.41 | 2.03 | 0 | 7 | 1.159 | -.138 | |||
| 지역사회 만족도 | 31.70 | 4.66 | 9 | 45 | -.331 | .508 | |||
| 내집단 신뢰 | 6.69 | .85 | 2 | 8 | -.770 | 1.170 | |||
| 제도 신뢰 | 7.11 | 1.78 | 3 | 12 | -.334 | -.203 | |||
사회적 상황 요인에 속한 각 변수의 빈도 및 평균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2,974명(29.9%),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6,977명(70.1%)이었다. 거주 형태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7,994명(80.3%), 전세 등을 포함한 임차 형태에 거주하는 노인은 1,957명(19.7%)이었다. 여가 단체 참여 빈도를 보면, 주당 평균 1.19회(SD=2.02)였고, 친밀하게 관계하는 인적 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3.46명(SD=2.75)이었다.
주관적 상황 요인에 속한 각 변수의 빈도 및 평균을 살펴보면, 15개의 문항을 갖고 관련 여부로 측정한 우울감의 평균은 3.09개(SD=3.24)였다. 5개 영역 5점 척도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의 수준의 경우, 평균 16.17점(SD=2.94)으로 중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0에서 7까지의 단일 서열척도로 측정한 종교 생활 참여의 강도를 보면, 평균 1.41(SD=2.03)로 종교 참여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9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한 지역사회 만족도는 평균 31.70(SD=4.66)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과 지인 관련 2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 내집단 신뢰는 평균 6.69점(SD=0.85)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부·언론·기업 3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 제도 신뢰는 평균 7.11점(SD=1.78)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변수의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속성이 파악된다. 가구 소득, 가구 지출, 인적 관계망에서 왜도 3과 첨도 10을 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은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의 일종으로 회귀계수 추정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기반한다는 특징을 갖기에, 변수 분포와 관련해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수의 왜도(skewness)나 첨도(kurtosis)가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2. 노인 자원봉사 참여 모형 분석 결과
다음에서는 연구 모형을 토대로 자료의 분포적 속성을 반영하여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과포화된 비참여(‘0’값)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석의 결과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먼저 과포화된 비참여(‘0’값)를 고려하지 않는 음이항 회귀분석에 의한 모형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성별(여성, z=3.099, p<.01), 교육연수(z=6.658, p<.001), 가구소득(z=2.143, p<.05), 주관적 건강(z=2.233, p<.05), 단체 참여(z=7.779, p<.001), 인적 관계망(z=2.924, p<.01), 삶의 만족도(z=2.728, p<.01), 종교 생활 참여(z=5.829, p<.001)가 자원봉사 참여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속한 17개의 독립 변수들 중 8개의 변수가 노인 자원봉사 활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노인 자원봉사 활동 빈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
| 구분 |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Model) | |||
|---|---|---|---|---|
| Estimate | SE | Z | ||
| Intercept | -11.294*** | 1.992 | -5.669 | |
| 인적자원 | 성별 | .610** | .197 | 3.099 |
| 연령 | .003 | .017 | .174 | |
| 교육연수 | .190*** | .029 | 6.658 | |
| 근로 | -.189 | .193 | -.981 | |
| 가구소득(ln) | .212* | .099 | 2.143 | |
| 가구소비(ln) | .139 | .162 | .855 | |
| 주관적 건강 | .295* | .132 | 2.233 | |
| 사회적상황 | 단체참여 | .317*** | .041 | 7.779 |
| 인적 관계망(ln) | .497** | .170 | 2.924 | |
| 거주지역 | .037 | .215 | .170 | |
| 거주형태 | .287 | .237 | 1.211 | |
| 주관적성향 | 우울감 | -.049 | .038 | -1.288 |
| 삶의 만족도 | .117** | .043 | 2.728 | |
| 종교생활 | .224*** | .038 | 5.829 | |
| 지역사회 만족도 | -.029 | .021 | -1.375 | |
| 내집단신뢰 | -.022 | .113 | -.192 | |
| 제도 신뢰 | .016 | .050 | .313 | |
다음에서는 분석 자료의 속성, 즉 과포화된 비참여(‘0’값)를 반영하여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에서 는 두 단계의 분석이 실행되는데, 먼저 1단계 영포화 모형은 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구조적 비참여)과 관련해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제시해 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z=2.819, p<.01) 및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z=1.994, p<.05)에 구조적 비참여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노인 여가 관련 단체 참여가 많을수록(z=-4.880, p<.001), 인적 관계망의 규모가 클수록(z=-2.398, p<.05),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z=-3.560, p<.001), 종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z=-6.534, p<.001), 제도 신뢰가 높을수록(z=-2.029, p<.05) 구조적 비참여의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해 보면, 연령이 낮고, 자가 형태로 거주하고, 노인 여가 관련 단체 참여가 많고, 인적 관계망의 규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고, 종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언론·기업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표 4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단계: 영포화 모형(자원봉사참여 여부) | 2단계: Count model(자원봉사참여 빈도) | |||||
|---|---|---|---|---|---|---|---|
| Estimate | SE | Z | Estimate | SE | Z | ||
| Intercept | 5.628* | 2.844 | 1.979 | -2.497 | 3.293 | -.758 | |
| 인적자원 | 성별 | -.332 | .288 | -1.156 | .003 | .343 | .010 |
| 연령 | .069** | .024 | 2.819 | .034 | .029 | 1.156 | |
| 교육연수 | -.072 | .038 | -1.915 | .090* | .041 | 2.206 | |
| 근로 | -.076 | .228 | -0.331 | -.188 | .238 | -.789 | |
| 가구소득(ln) | -.209 | .136 | -1.533 | -.188 | .185 | -1.016 | |
| 가구소비(ln) | -.183 | .236 | -.774 | -.036 | .299 | -.121 | |
| 주관적건강 | -.171 | .160 | -1.069 | .023 | .165 | .139 | |
| 사회적 상황 | 단체 참여 | -.261*** | .054 | -4.880 | .032 | .046 | .695 |
| 인적 관계망(ln) | -.559* | .233 | -2.398 | .248 | .249 | .994 | |
| 거주지역 | .199 | .296 | .670 | .328 | .324 | 1.015 | |
| 거주 형태 | .640* | .321 | 1.994 | .851* | .390 | 2.179 | |
| 주관적 성향 | 우울감 | -.103 | .072 | -1.433 | -.162* | .077 | -2.112 |
| 삶의 만족도 | -.198*** | .056 | -3.560 | -.043 | .058 | -.743 | |
| 종교생활 | -.352*** | .054 | -6.534 | -.095 | .050 | -1.909 | |
| 지역 사회 만족도 | .010 | .027 | .359 | -.014 | .031 | -.462 | |
| 내집단 신뢰 | .286 | .190 | 1.504 | .398 | .204 | 1.949 | |
| 제도 신뢰 | -.131* | .065 | -2.029 | -.153* | .073 | -2.102 | |
다음으로 잠재적인 자원봉사 노인 및 자원봉사 참여 노인에 초점을 두며 독립변수와 자원봉사 참여 빈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2단계 횟수(Count) 모형에 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횟수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노인의 교육 기간이 길수록(z=2.206, p<.05),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z=2.179, p<.05), 우울감이 낮을수록(z=-2.112, p<.05), 제도 신뢰가 낮을수록(z=-2.102, p<.05) 자원봉사 참여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해 보면, 노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우울감)의 상태가 더 양호할수록, 정부, 기업, 언론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분석 방법에 대한 비교, 즉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 방법이 보다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각 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첫째, 분석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의 선택과 확인하기 위하여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성을 비교한 결과, <표 6>의 아래 부분에 제시되듯이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고, 두 모형 간 AIC 차이가 2 이상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Burnham & Anderson, 2002),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AIC 값이 음이항 회귀분석의 AIC 값보다 100 이상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Vuong’s 검정의 결과에서도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이 음이항 회귀분석보다 모형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6.133, p<.001). 이런 결과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참여 여부 현상에서와 같이 0값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경우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이 보다 적합한 분석 방법이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5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과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 정리
| 구분 |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 |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 ||
|---|---|---|---|---|
| 1단계: Binomial1) logit(자원봉사참여 여부) | 2단계: Count model(자원봉사참여 빈도) | |||
| 인적자원 | 성별 | +** | ||
| 연령 | -** | |||
| 교육연수 | +*** | +* | ||
| 근로 | ||||
| 가구소득(ln) | +* | |||
| 가구소비(ln) | ||||
| 주관적건강 | +* | |||
| 사회적상황 | 단체 참여 | +*** | +*** | |
| 인적 관계망(ln) | +** | +* | ||
| 거주지역 | ||||
| 거주 형태 | -* | +* | ||
| 주관적성향 | 우울감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종교 생활 | +*** | +*** | ||
| 지역사회 만족도 | ||||
| 내집단 신뢰 | ||||
| 제도 신뢰 | +* | -* | ||
| AIC | 2,845.196 | 2,736.489 | ||
| Vuong’s test | z=6.133*** | |||
둘째,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빈도에 대한 분석, 즉 참여 강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음이항 회귀 분석의 결과와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분석 방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변수는 교육 수준 변수 하나뿐이었다. 이는 노인 자원봉사참여 여부 현상에서와 같이 0값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경우 음이항 회귀모형이 자원봉사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0’값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변수의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빈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1단계(영포화 모형)와 2단계(영포화 확률을 고려한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 관계상 일관적인 방향성을 갖는 변수가 없었다. 두 변수의 경우, 관계의 방향성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거주 형태와 제도 신뢰의 경우, 참여 여부와 참여 빈도에서 관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종속변수의 속성에 따라, 즉 자원봉사 참여 여부인지 혹은 참여 강도인지에 따라 다른 작용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분석하는 자료의 분포적 속성, 특히 종속변수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독립변수의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보다 적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분석할 때 종속변수가 참여 여부인지 혹은 참여 강도인지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위해서는 분석 자료의 구조적 속성을 반영한 분석 모형의 적용이 현상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스스로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며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점을 갖는 의미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 그리고 이에 기반한 노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전략 마련은 주요한 학술적 과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 자료의 속성, 즉 과도한 0값(zero inflation)의 문제를 해소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분석하면서, 적합한 분석 방법의 선택에 따라 동일 모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과도한 0값(zero inflation)의 문제를 해소하는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은 일반 음이항 회귀분석보다 연구 자료의 분포적 속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 방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음이항 회귀분석은 자원봉사 미참여(0값)의 구조적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해 특정 변수의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의 빈도를 중심으로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노인의 교육 수준 하나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단체 참여, 인적 관계망, 삶의 만족도, 종교 활동, 거주 형태, 우울감, 제도 신뢰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은 모두 일반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와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 활동 빈도에서와 같이 자원봉사 미참여(0값)가 과다하게 분포하는 경우, 자료의 분포적 속성에 맞는 적합한 분석 방법의 선택과 결과 제시가 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의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령, 단체 참여, 인적 관계망, 자가 거주, 삶의 만족도, 종교 활동, 제도 신뢰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반면,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연수, 임차 가구 거주, 우울감, 제도 신뢰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의 구축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단순한 참여와 지속적 참여라는 상이한 현상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의 마련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두 현상에 대한 정교한 이해 구축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접근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구 방법의 선택과 적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계량적 분석의 진화에 맞춰 분석 자료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여 분석하는 세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런 노력이 없이 생성되는 자료 분석의 결과는 타당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참여 구조가 복합적일 수 있고 미참여(0값)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 빈도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고자 할 때, 포아송 회귀분석의 방법이나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 등의 적용이 비적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상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료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의 적용과 비교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이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 계량적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 노력의 과정에서 이러한 세심함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계량적 방법의 선택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계량적 분석 기법의 선택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상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이해 마련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내용은 향후 자원봉사 활동의 빈도와 같은 유사 현상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며 분석 자료의 분포 속성을 보다 정교히 반영해 내는 분석 방법의 선택 노력이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결과와 해석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사실을 시사해준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접근과 지속적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접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주요 영향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활동 기반, 구체적으로는 복지관, 노인회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촉발시키는 접근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참여 강도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가 노인의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 강도와 관련해서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과 관리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 등에서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과 더불어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노인 자원봉사자의 정서적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인과적 이해를 구축하는데 다소의 제한점을 갖는다. 참여 여부, 참여 강도, 참여 지속성과 같은 현상을 담고 있는 자원봉사 행동은 시간적 연속성을 반영하는 행동이기에, 이에 대한 인과적 설명 및 시간 변화에 따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자료에 기반하기에, 자원봉사의 참여 및 강도에 대한 이해에서 분명한 인과성과 역동성을 제시하는 방식의 지식 마련과 구축에서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구축하면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진입, 유지, 이탈 등의 전 과정을 보다 상세하고 분명하게 파악해 내는 인과적 접근 및 역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분석이 지니는 제한성을 그대로 갖는다. 분명, 노인실태조사 자료는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제고시키는데 매우 높은 유용성을 갖는 2차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노인의 자원봉사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이끄는 모든 요인을 담아낼 수는 없기에,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른 차이,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 노인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상황인지에 따른 차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규모와 질에 따른 차이 등을 반영시켜 분석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이전 연구에서는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며 분석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유급 자원봉사에의 참여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구분하여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노인 자원봉사 행동의 내용에는 유급 자원봉사와 무급 자원봉사가 모두 포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제한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영포화 음이항 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와 더불어 참여 강도에 대한 이해도를 구축하면서 실증적인 지식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자원봉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료의 속성과 분석 방법 간의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지식 구축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 및 결과에 기반해서 보다 정교하게 정책적 함의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향후 종단 자료의 구축과 더불어 분석 자료 속성에 적합한 신뢰성 높고 타당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서 노인의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지식을 더욱 심화 및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이 더욱 정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관련 현상과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맞춰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Notes
음이항 회귀분석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θ는 과대산포(overdispersion) 조절 모수로 이를 통해 분산이 μi 보다 클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과산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Cameron & Trivedi, 1986).
References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2023. 12. 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03967
보건복지부. (2023).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별/시도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7004&conn_path=I2
행정안전부. (2024). 인구대비 현황. 1365자원봉사포털 통계. https://www.1365.go.kr/vols/1472177522467/srvcgud/volsStats.do
, , , , , , & (2021). Helping out or helping yourself?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the retirement transition. Psychology and aging, 36(1), 119. [PubMed]
, , & (2013). The reliability of a two-item scale: Pearson, Cronbach, or Spearman-Brow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4), 637-642. [PubMed]
, & (2004). Volunteerism and Socioemotional Selectivity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5), 251-257. [PubMed]
, &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PubMed]
, , , & (2007).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62(1), S69-S73. [PubMed]
, , & (2018). Productive aging via volunteering: Does social cohesion influence level of engagement?.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61(8), 817-833. [PubMed]
, &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PubMed]
, , , & (2023).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8(5), 902-912. [PubMed]
, & (2008). The Impact of Obesity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5(4), 409-42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2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26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7-31

- 147Download
- 140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