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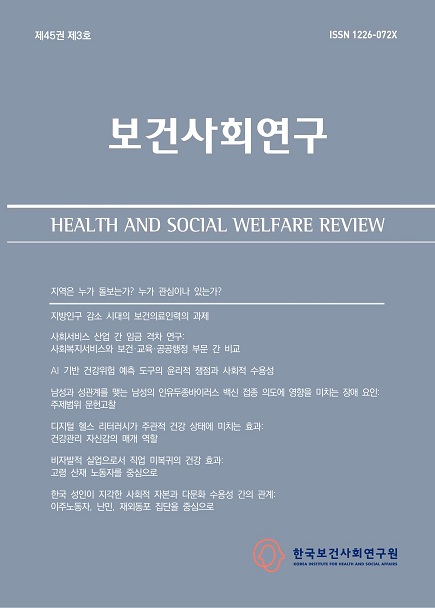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Exclusion Types among Young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Song, Dohun1; Jeong, Kyu-Hyoung1*; Kim, Yiseul1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168-192,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168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는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제를 개별 영역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청년 1인 가구는 고용, 주거,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양상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었고, 또 다른 집단은 경제적 여건은 양호하지만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등 비경제적 요인에서 배제 위험이 높았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의 결핍이 중첩되거나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고용 지원이나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사회적 배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주거 안정,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연결망 회복 등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배제의 양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복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tential types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young adults living alone a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m. We analyzed data from 5,355 young adults aged 19-34 living alone, using the 2022 Youth Life Survey. Employ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we categorized social exclusion among these young adult households into three types: (1) employment, housing, and economic exclusion, (2) multiple exclusion, and (3) partial health and housing exclusion. For each type, the key determinants identified were gender, education level, region of residence, disposable income, and personal deb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is multidimensional, with interrelated effects including employment and economic insecurity, housing vulnerability, poor health, and social isol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초록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ata/MP 17.0과 Mplus 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9~34세 청년 1인가구 5,355명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다중배제형’,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성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가처분소득, 개인 부채 등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이 확인되었다.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특성을 띠며, 특히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 주거 취약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상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차원으로 포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경제적 빈곤만을 측정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영역에서 자원과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박능후, 최민정, 2014). 외환 위기 이후 실업률과 빈곤율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의 해체, 생계형 범죄, 노숙자 증가 등 기존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도 사회적 배제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문진영, 2010, 박능후 외, 2015, 이원호, 2011).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사회에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관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Walsh et al., 2017). 또한 한 영역에서의 배제는 연쇄작용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배제를 강화시킨다는 특징이 있다(Precupetu et al., 2019).
청년 1인 가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분절적이고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청년은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이 되었다(박나리, 김교성, 2021). 2024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6.5%로 전체 실업률 3.0%보다 2배 이상 높고, 체감 실업률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24).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난항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의 부재는 청년의 생활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현주, 2018). 또한 고용, 소득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까지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져 청년의 생애 과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박나리, 김교성, 2021). 박미선과 조윤지(2022)에 의하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25.1%가 청년 1인가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과 소형 및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세의 월세 전환 등과 맞물려 삶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이태진 외, 2016). 이에 더해 실업 장기화와 주거빈곤이 청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장재윤 외, 2006; Kim & Yoo, 2021). 실제로 청년층의 당뇨 환자는 2013년 17,357명에서 2017년 24,106명으로 38.9%, 우울증 환자는 47,721명에서 75,602명으로 58.4% 증가하였으며, 공황장애 환자의 수는 7,913명에서 16,041명으로 5년간 2배 이상 급증하였다(서한기, 2018). 이는 청년세대는 일반적으로 건강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가구는 그 특성상 위기나 긴급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지지체계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와 고립감, 우울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어렵고 다인가구에 비해 자기방임의 위험성이 높다(김정은, 2020). 즉 1인가구는 비교적 쉽게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에 노출된다. 이렇듯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과 1인가구가 교차하는 집단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협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청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인정, 김미영, 2021)과 최근 청년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선아, 2023)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문제라고 여겨지던 건강, 사회적 관계의 단절·고립의 문제가 청년에게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경우 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청년 1인가구가 처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차원적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용 배제의 경험이 경제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제 배제의 경험이 주거 배제의 가능성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배제의 연쇄작용(박나리, 김교성, 2021; Precupetu et al., 2019)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일한 차원의 분절적 접근 방식이 아닌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 접근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를 주로 노동시장과 교육 성과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Byun, 2018; Kluve et al., 2019). 즉,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되며, 고용 이행과 소득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와 연계된 주거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문제 등은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 1차 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단순 노무직 종사자일수록 사회적 배제 경험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김선기 외, 2016), 이러한 계층 간 차이가 청년 1인가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청년 1인가구의 배제 문제를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노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홍승희, 김지명, 2021). 예를 들어,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지만(금유빈 외, 2021), 이러한 건강 불평등이 청년 1인가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차별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 문제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Moscone et al., 2016; Zeng, 2012). 그러나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절, 정신건강 악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황민지, 기명,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다차원적 배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특히 배제 유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넷째, 주거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박선영, 이재림 2022). 특히, 청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 청년보다 주거비 부담을 독립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생활 수준 저하 및 사회적 관계 단절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를 노동시장 내 배제의 문제로 국한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서현, 2023; 김선기 외, 2016; 신민경, 김희연, 2023), 청년 1인가구의 배제 문제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배제 유형과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의 배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배제의 개념 및 구성
사회적 배제는 196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René Lenoir(1974)가 ‘배제된 자(les exclus)’ 즉, 장기적인 경제 불황 상황 안에서 지속적인 근로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집단이 프랑스 인구의 약 10%임을 주장하면서 유럽 사회에 사회적 배제 담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강신욱, 2006; Silver, 1994). 당시 유럽은 경제성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이는 기존 전통적 빈곤의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의 원인, 빈곤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게 하였다(김안나, 2007a; 심창학, 2003).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사회적 배제 개념이 조명받기 시작하였다(문진영, 2010). 실업률 및 빈곤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해체, 생계형 범죄, 노숙자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회적 배제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박능후 외, 2015; 문진영, 2010; 이원호, 2011).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학자와 학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를 처음 학문적으로 논의한 Max Weber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으며, 특정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보았다(문진영, 2004; Burchardt et al., 2002). Giddens(1998)는 주류 집단으로부터 특정 집단을 분리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고, Pierson(2002)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 살펴보면, 강신욱 외(2005)는 사회적 배제를 개인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권리를 제약당하는 상태로 보았고, 신명호(2004)는 특정 집단이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 배제란 빈곤과 같이 경제적 결핍과 불평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보다 동태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결핍과 불평등을 다루는 개념이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 배제(소득 부족, 고용 기회 부족), 제도적 배제(복지 및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사회적 관계 배제(사회적 네트워크 단절, 가족 및 공동체와의 관계 단절), 문화적 배제(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서의 배제) 등의 차원에서 분석해 왔다(Atkinson, 1998; Levitas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기존 사회적 배제 개념은 주로 실업자, 노년층,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청년 1인가구가 경험하는 배제 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Cheung & Yeung, 2021).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경제적 배제는 청년 1인가구의 배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들이 겪는 배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주거 불안정 등의 요소가 결합하여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황민지, 기명, 2024). 이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배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가 가진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 실태 파악에 적합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신욱 외(2005)는 Atkinson et al.(2002)의 연구에 기초해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의 8가지 영역으로 사회적 배제를 세분화 하였다. 김안나(2007b)는 사회적 배제를 빈곤, 근로 빈곤, 실업, 주거 환경 미비, 교육기회 결여, 의료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 정보/서비스 소외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교성과 노혜진(2008)은 주거, 재정, 고용, 사회참여, 건강, 교육 등 6가지 영역을 퍼지이론을 통해 객관적 측정하여 종단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소를 재구성하여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다(김혜자 외, 2014; 박능후, 최민정, 2014; 최재성, 김혜진, 2019, 황선영 외, 2019). 특히, 청년의 배제에 관해서는 노동시장,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비오, 2019; 김정숙, 2018; 문영만, 홍장표, 2017). 이러한 연구 동향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지표를 고용, 건강,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여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는 노인 1인가구를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청년 1인가구의 취약함이 주목받으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장온정, 2022). 특히 1인가구 중 청년의 비율이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인정, 김미영, 2021; 통계청, 2022). 청년 1인가구는 기존 사회적 배제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청년 1인가구의 배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 1인가구는 주거 불안정과 노동시장 배제가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박나리, 김교성, 2021). 기존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경제적 배제와 주거 배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이 결합하여 배제의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황민지, 기명, 2024). 둘째,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배제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년층 1인가구와는 다른 특징으로, 노년층은 공공 복지서비스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청년 1인가구는 가족 지원이 단절된 상태에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박민진, 김성아, 2022).
청년 1인가구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소득과 소비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광석, 2015). 그 중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 빈곤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김태완, 최준영, 2017), 노동시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으로(박나리, 김교성, 2021) 실업률 역시 다인가구보다 높고 불안정한 직장이나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나, 이민홍, 2016). 또한 1인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 중 주거비로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1인가구의 대다수가 다세대주택, 원룸, 고시원, 반지하방 등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강미나 외, 2020).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가족과 분리되어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에 주거공간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애리 외, 2017). 이러다 보니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과부담 비율과 열악한 환경의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에 더해,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신체건강 수준이 낮으며, 우울감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여봉, 2017). 1인가구의 유병률, 우울감, 활동제한 경험 인구의 비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허재헌, 2018),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다인가구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경, 이성림, 2017). 또한 청년 1인가구는 흡연율과 음주율, 불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 행동과 관련해서도 다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현, 2021; 장온정, 2022). 더욱이 문제는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빈곤으로 고시원, 원룸과 같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면서 물질적 고립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며(하성웅, 2021),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의 문제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서울시 청년 고독사의 비중은 73건으로 전체 고독사의 약 10%를 차지하였다(강유경, 장수안, 2021). 이는 앞서 언급한 청년 1인가구가 겪는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은데, 실업 장기화와 주거빈곤이 청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장재윤 외, 2006; Kim & Yoo, 2021). 한 영역에서의 배제는 연쇄작용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배제를 강화시킨다는(박나리, 김교성, 2021; Precupetu et al., 2019) 관점에서 본다면 고독사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고립만의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년층이나 청년 전체 집단을 중심으로 다차원적 배제 양상을 분석하는 흐름이 주를 이루어 왔다(박영미, 2008; 이용호·박로사, 2021; Chung et al., 2019).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는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소득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배제 유형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이현정, 2015), 청년층 연구에서는 주로 고용 불안정, 주거 취약성, 사회참여 부족 등이 중심 지표로 활용되었다(신자현 외, 2023). 그러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청년 1인가구에 특화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기존 연구는 주로 고용·소득·주거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나 건강 영역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반대로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주요한 배제 지표로 작용하나, 청년 1인가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주거 취약성 또한 핵심 차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청년층 및 노년층 연구와의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3.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고찰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김소은 외, 2016; 최재성, 김혜진, 2019; Chung et al., 2019; Feng et al., 2018; Jose & Cherayi, 2017; Micklewright, 2002),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이용호, 박로사, 2021; Lee & Park, 2024) 그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의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영미, 2008; 신자현 외, 2023; Chung et al., 2019), 성별에 따라 고용 상태, 수입, 가족생활 등에서 축적된 경험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배제의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미영, 2008). 또한 경제적 배제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1.4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2007b). 연령 역시 사회적 배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김교성, 노혜진, 2008; 김안나, 2007a). 고령일수록 경제적 배제와 근로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안나 외, 2008), 특히 노인 중에서도 후기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화옥, 김유경, 2009; Chung et al., 2019, Feng et al., 2018). 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의 기회를 얻을 확률이 낮아져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빈곤하며 경제적인 배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배제에 있어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미미하며 과대하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Victor et al., 2005). 이렇듯 연령과 교육수준은 모두 사회적 배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본 연구는 대상을 청년 1인가구로 주목함에 따라 청년기는 만 19~34세로 연령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아직 학업을 이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분석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거주지역의 경우 주요한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이용호, 박로사, 2021). 노인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김교성, 노혜진, 2008)와 농촌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최재성, 김혜진, 2019)가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임금장애근로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동환, 2014). 경제적 자원 또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Jose and Cherayi(2017)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현저히 높았고, Chung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소득은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중 세 영역 이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현주, 정순둘, 2012)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이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미, 2008; 윤홍식, 2003).
이 외에도, 청년 1인가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흡연, 음주 등의 부정적 건강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진현, 2021; 장온정, 2022),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상태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배제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고 있다(송미영, 2008; Demakakos, 2009). 즉, 부정적 건강행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사회적 배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 혹은 이혼 및 사별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며 특히 미혼이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Barnes et al., 2006; Demakakos, 2009). 또한 1인가구의 특성상 위기 시 개입하거나 지원할 인적자원의 부재로 자기방임의 위험성이 높다(김정은, 2020). 즉, 청년 1인가구는 취약한 사회적 관계로 인한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히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15,000가구를 목표로 확룰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고, 동부와 읍면부 표본 배분은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추출되어 최종적으로 14,966명의 청년을 포함하고 있다(정세정 외, 202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4,966명 중 가구원 수가 1인인 청년 5,355명을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 도구
가. 사회적 배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고용, 건강,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로 분류하였으며(김혜자 외, 2014; 박능후, 최민정, 2014; 최재성, 김혜진, 2019, 황선영 외, 2019) 이 다섯 가지 배제지표를 기반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정한 기준점을 두고 배제와 비배제로 나누어 접근하였다(김안나, 2007b; 송승연, 2016; 이정화, 오영은, 2016). 이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각 집단이 가진 배제의 영역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역별로 배제는 1, 비배제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지표별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고용 배제의 지표는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물어 ‘실업자’, ‘비경제활동’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배제(1), ‘취업자’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배제(0)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김수진 외, 2020; 한상윤, 남석인, 2021; Gingrich & Lightman, 2015). 건강배제의 지표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물어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배제(1), ‘매우 좋음’,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비배제 (0)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김수진 외, 2020; 한상윤, 남석인, 2021). 주거 배제의 지표는 2022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4.8m2를(박미선, 조윤지, 2022) 기준으로 ‘주거면적이 34.8m2 미만’인 경우를 배제(0), ‘34.8m2 이상’ 인 경우를 비배제(0)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경제 배제의 지표는 월평균 소득이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1,944,812원 미만’인 경우를 배제(1), ‘1,944,812원 이상’인 경우를 비배제(0)로 코딩하였다. 사회적 관계 배제의 지표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여부를 물어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배제(1), ‘있음’을 비배제(0)로 코딩하였다(김안나, 2007b; 김은하, 2014; 박현주, 정순둘, 2012; 이용호, 박로사, 2021).
표 1
사회적 배제 지표구성
| 영역 | 지표 | 분류기준 | 명(%) | |
|---|---|---|---|---|
| 고용 | 취업 여부 | 1 배제 | 취업 | 1,392(25.99) |
| 0 비배제 | 실업, 비경제활동 | 3,963(74.01) | ||
| 건강 | 주관적 건강인식 | 1 배제 | 매우좋지않음, 좋지 않음 | 2.,439(45.55) |
| 0 비배제 | 매우좋음, 좋음 | 2,916(54.45) | ||
| 주거 | 1인당 평균 주거면적 | 1 배제 | 34.8m2 미만 | 2,738(51.13) |
| 0 비배제 | 34.8m2 이상 | 2,617(48.87) | ||
| 경제 | 중위소득 | 1 배제 | 중위소득 미만 | 2,275(42.45) |
| 0 비배제 | 중위소득 이상 | 3,080(57.52) | ||
| 사회적 관계 |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 | 1 배제 | 없다 | 633(11.82) |
| 0 비배제 | 있다 | 4,722(88.18) |
나. 사회적 배제 결정 변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유형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은 성별(남성=0, 여성=1), 교육수준, 거주지역(수도권=0, 비수도권=1)을 투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대학 재/휴학, 대학 졸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은 연평균 가처분소득과 개인 부채를 로그로 치환하여 연속형으로 투입하였다. 건강측면은 흡연 여부(비흡연=0, =1), 고위험 음주(저위험 =0, 고위험=1)를 투입하였으며,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군으로 보았다. 사회관계 측면은 정기적인 여가활동 여부(있음=0, 없음=1),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여가활동 여부는 1년 이내 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과 정기적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한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한 번이라도 있다면 있음으로, 없다면 없음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등 5가지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묻는 내용으로 ‘가족’, ‘지인’, ‘공공 기관’, ‘민간 기관’을 복수 응답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 수를 평균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유형화를 위해 Mplus 8.0을 활용하여 잠재집단을 추출하였으며, Stata/MP 17.0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 잠재유형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기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배재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유형 수를 설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AIC, BIC, SABIC, Entropy, BLRT의 p값을 활용하였다. Muthén & Muthén(2000)에 따르면, AIC와 BIC, SABIC는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로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 Entropy는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BLRT는 잠재집단 수를 k라고 했을 때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k-1 집단 모형은 기각되고 k 집단이 더 적합한 것을 말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카이제곱 분석과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적 배제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51.50%로 여성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58.95%로 가장 많았고 대학 재/휴학 26.97%, 고등학교 이하 14.0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31.30%, 비수도권 68.70%로 비수도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연 평균 2,486.5만 원(SD=1,526.1)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부채는 1,226.79만 원(SD=3589.37)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여부는 있음이 80.04%, 없음이 19.96%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5,355)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성 | 2,758 |
| 여성 | 2,597 |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이하 | 754 |
| 대학 재/휴학 | 1,444 | |
| 대졸 이상 | 3,157 | |
| 거주지역 | 수도권 | 1,676 |
| 비수도권 | 3,679 | |
| 가처분소득 | 평균 표준편차 |
2486.532 |
| 1526.124 | ||
| 개인 부채 | 평균 표준편차 |
1226.79 |
| 3589.34 | ||
| 여가활동 여부 | 있음 | 4,286 |
| 없음 | 1,069 |
2.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 도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5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통해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평가를 AIC, BIC, SSABIC, Entropy, BLRT의 p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AIC와 BIC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으며, 2~3개로 잠재유형을 늘려갔을 때는 감소하였으나 4개로 늘렸을 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의 분류가 좋음을 의미한다 (Weller et al, 2020). BLRT의 p값이 유의미한 경우, 잠재계층 수 k인 모형이 k-1인 모형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표를 종합하여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였다. 우선 AIC, BIC, SSABIC가 2개에서 3개로 잠재계층 수가 늘어날 때 모두 감소하여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모형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여 과적합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BLRT p값 또한 3개 모형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4개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약화되었다. 비록 Entropy 값이 2개 모형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잠재계층 분석에서 Entropy는 단일 기준이 아닌 보조 지표로 활용되며, 모형 선택 시 여러 적합도 지표와 함께 모형의 단순성과 해석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간주된다(Muthén & Muthén, 2000; Nylund et al., 2007). 특히 잠재계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Entropy 값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정보 기준(AIC, BIC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BLRT가 유의미하며, 각 계층이 충분한 사례 수와 명확한 해석 가능성을 보이는 경우, 해당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Nylund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C, BIC 등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가 가장 낮고 BLRT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분류의 명확성과 통계적 안정성,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 유형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모형 적합도 검증
| 구분 | 모형 적합도 | 잠제계층 분류율 | ||||
|---|---|---|---|---|---|---|
| AIC | BIC | SSABIC | Entropy | BLRT p-value |
n(%) | |
| 1 | 32,142.23 | 32,175.16 | 32,159.25 | - | - | - |
| 2 | 30,347.12 | 30,419.63 | 30,384.68 | .715 | 1772.629*** | 2370(44.26%), 2985(55.74%) |
| 3 | 30,263.75 | 30,375.71 | 30,321.69 | .654 | 93.621*** | 1720(32.12%), 621(11.60%), 3,014(56.28%) |
| 4 | 30,267.08 | 30,418.55 | 30,345.47 | .600 | 8.504 | 990(18.49%), 770(14.38%), 617(11.52%), 2978(55.61%) |
3개의 잠재계층 유형별 분류를 토대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특성을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잠재계층 유형 1은 고용 지표(60.9%), 주거 지표(73.1%), 경제 지표(92.7%)가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을 보였으며, 건강 지표(26.9%), 사회적 관계(4.3%)가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였다. 이에 유형 1은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은 청년 1인가구 표본의 32.12%로 나타났다.
표 4
잠재계층 조건부 응답확률
| 지표 | 잠재계층 1 | 잠재계층 2 | 잠재계층 3 |
|---|---|---|---|
|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 다중배제형 | 건강·주거 부분배제형 | |
| 32.12% | 11.60% | 56.28% | |
| 고용 | 60.9% | 46.7% | 2.6% |
| 건강 | 26.9% | 71.7% | 46.9% |
| 주거 | 73.1% | 44.7% | 42.2% |
| 경제 | 92.7% | 89.2% | 3.7% |
| 사회적 관계 | 4.3% | 27.1% | 11.0% |
잠재계층 유형 2는 건강 지표(71.7%), 사회적 관계(27.1%)가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을 보였으며, 경제 지표는 89.2%로 절대값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 지표(46.7%), 주거 지표(44.7%)는 중간 수준의 조건부 확률을 보였으며, 유형 1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유형 2는 ‘다중배제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은 청년 1인가구 표본의 11.60%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잠재계층 유형 3은 고용 지표(2.6%), 경제 지표(3.7%)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였고, 사회적 관계 지표는 11.0%로 낮은 수준의 조건부 확률을 보였다. 건강 지표(46.9%), 주거 지표(42.2%)는 중간 수준의 조건부 확률을 보여 건강 및 주거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형 3은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유형은 청년 1인가구 표본의 5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별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은 남성이 54.6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고, 교육수준은 대학 재/휴학이 61.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이 72.67%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1202.87만 원(SD=885.52)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부채의 평균은 316.98(SD=1294.97)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76.10%로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는 저위험군이 91.28%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작은 비율이었다. 여가활동 여부는 있음이 77.67%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1.48(SD=.49)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표 5
사회적 배제 유형별 개인 특성
(n: 5,355)
| 지표 |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a) | 다중배제형(b) | 건강·주거 부분배제형(c) | Chi-2/F | |
|---|---|---|---|---|---|
| 명(%) | 명(%) | 명(%) | |||
| 성별 | 남성 | 940(54.65%) | 286(46.05%) | 1,532(50.83%) | 14.75** |
| 여성 | 780(45.35%) | 335(53.95%) | 1,482(49.17%) | ||
| 교육수 준 | 고등학교 이하 | 121(7.03%) | 96(15.46%) | 537(17.82%) | 1.8e+03*** |
| 대학재/휴학 | 1,053(61.22%) | 249(40.10%) | 142(4.71%) | ||
| 대졸 이상 | 546(31.74%) | 276(44.44%) | 2,335(77.47%) | ||
| 거주지 역 | 수도권 | 470(27.33%) | 170(27.38%) | 1,036(34.37%) | 30.32*** |
| 비수도권 | 1,250(72.67%) | 451(72.62%) | 1,978(65.63%) | ||
| 가처분 소득 | 평균 표준편차 | 1202.87 | 1178.07 | 3488.67 | 195.00*** c>a,b |
| 885.52 | 787.09 | 1125.01 | |||
| 개인 부채 | 평균 표준편차 | 316.98 | 493.11 | 1897.16 | 2.6e+03 c>a,b |
| 1294.97 | 2074.12 | 4474.18 | |||
| 흡연 | 흡연 | 411(23.83%) | 148(23.83%) | 732(24.29%) | 0.12 |
| 여부 | 비흡연 | 1,309(76.10%) | 473(76.17%) | 2.282(75.71%) | |
| 고위험 음주 여부 | 고위험 | 136(8.73%) | 90(12.55%) | 389(12.63%) | 16.41*** |
| 저위험 | 1,422(91.28%) | 627(87.45%) | 2,691(87.37%) | ||
| 여가활 동 여부 | 있음 | 1,336(77.67%) | 419(67.47%) | 2,531(83.97%) | 96.62*** |
| 없음 | 384(22.33%) | 202(32.53%) | 483(16.03%) | ||
| 사회적 지지 | 평균 표준편차 | 1.48 | 1.35 | 1.45 | 8.35* a,c>b |
| .49 | .52 | .53 |
‘다중배제형’은 여성이 53.95%로 모든 유형 중 유일하게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4.44%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72.62%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1178.07만 원(SD=787.09)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개인 부채의 평균은 493.11만 원(SD=2074.12)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76.17%로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는 저위험군이 87.45%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여부는 있음이 67.47%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평균 역시 1.35(SD=.52)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은 남성 50.83%로 모든 유형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가장 유사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77.47%로 모든 유형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이 65.63%로 모든 유형 중 비수도권 비율이 가장 적었다. 가처분소득의 평균은 3488.67만 원(SD=1125.01)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으며 개인 부채 역시 1897.16(SD=4474.18)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75.71%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는 저위험군이 87.37%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여부는 있음이 83.9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1.45(SD=.53)으로 나타났다.
3. 청년 1인가구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
사회적 배제 유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건강· 주거 부분배제형’을 기준으로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을 살펴보면, 교육수준(OR=.76, p<.001),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OR=.58, p<.001), 가처분소득(OR=.01, p<.001), 개인 부채(OR=.91, p<.01)가 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에 비해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24% 낮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일수록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42%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처분소득과 개인 부채가 많을수록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에 속할 확률이 각각 99%, 9%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6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
(n: 5,335)
| 구분 | 고용·경제·주거 배제형 (ref. 건강·주거 부분배제형) |
다중배제형 (ref. 건강·주거 부분배제형) |
|||||
|---|---|---|---|---|---|---|---|
| B | S.E. | OR | B | S.E. | OR | ||
| 인구사회학적 측면 | 성별 (ref. 남성) | -.138 | .148 | .87 | .457** | .158 | 1.58 |
| 교육수준 | -.272** | .093 | .76 | -.049 | .102 | .95 | |
| 비수도권 (ref. 수도권) | -.542*** | .152 | .58 | -.612*** | .160 | .54 | |
| 경제적측면 | 가처분소득 | -4.287*** | .144 | .01 | -4.173*** | .148 | .02 |
| 개인 부채 | -.091*** | .018 | .91 | -.048** | .018 | .95 | |
| 건강측면 | 흡연여부 (ref. 비흡연) | .107 | .181 | 1.11 | .312 | .192 | 1.37 |
| 고위험음주 (ref. 저위험) | -.037 | .221 | .96 | .340 | .228 | 1.40 | |
| 사회관계 측면 | 여가활동 여부 (ref. 있음) | -.045 | .140 | .96 | .145 | .147 | 1.15 |
| 사회적 지지 | .141 | .131 | 1.15 | .043 | .139 | 1.04 | |
| 모형적합도 | log likelihood | -2149.3824 | LR chi2(30) | 5838.80 | |||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을 기준으로 ‘다중배제형’을 살펴보면, 성별(OR=1.58 ,p<.01)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OR=.54, p<.001), 가처분소득(OR=.01, p<.001), 개인 부채(OR=.95, p<.01)가 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대비 여성일수록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58%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일수록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46% 더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처분소득과 개인 부채가 많을수록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99%, 5% 더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잠재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 각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19~34세의 청년 1인가구 5,355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 응답자의 사회적 배제 유형은 ‘고용·주거·경제 배제형’(32.12%), ‘다중배제형’(11.60%), ‘건강·주거 부분배제형’(56.28%)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단일 차원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배제로 구성된다는 기존 이론적 관점(Atkinson et al., 2002; Levitas et al., 200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은 경제적 자원 결핍과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이 중첩된 집단으로, Weber(1978)의 사회적 폐쇄 이론에서 설명하는 자원 접근의 제한과 구조적 배제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자원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다차원적 취약성을 경험하는 유형이다. ‘다중배제형’은 고용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건강 영역에서도 높은 배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복합적 사회적 배제 현상이 청년층 일부에서 집중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Levitas et al., 2007). 이러한 유형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배제까지 포괄하는 심화된 배제 상태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은 고용 및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주거 환경과 주관적 건강 측면에서 배제 경험이 높은 집단으로, 이는 전통적 빈곤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즉, 단순 소득 수준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생활 질의 저하와 복지 접근의 격차가 배제의 또 다른 축임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별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처분소득, 부모 교육수준, 음주빈도, 여가활동 여부, 사회참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유형 중 유일하게 ‘다중배제형’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이 높은 차이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세 유형 모두 비수도권이 더 많았지만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의 비수도권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처분 소득은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장 적은 ‘다중배제형’과 비교해 약 3배의 차이였다. 부모 교육수준은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는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의 저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있음의 비율은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이 가장 높았다.
셋째, 청년 1인가구 사회적 배제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남성 대비 여성일수록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에 비해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배제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박영미, 2008; 신자현 외, 2023; Chung et al., 2019)와 일치하며, 사회적 폐쇄 이론(Weber, 197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과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에 비해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배화옥, 김유경, 2009; Chung et al., 2019, Feng et al., 2018)를 지지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원 접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적자본이론(Becker, 1994)에 적용시켜볼 때, 교육 격차가 고용 불안정과 주거 불안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일수록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에 비해 ‘고용· 주거·경제 배제형’과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신동환 2014; 이용호, 박로사, 2021). 또한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선행연구(배병우, 남진, 2013; 이현정, 2015)를 고려해 봤을 때 수도권에 밀집된 많은 인프라와 경쟁적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 계층은 소외되어 더 큰 격차를 느끼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적 배제 이론(Davoudi & Atkinson, 2000)이 지적하는 지역적 불평등의 구조와도 연결된다. 가처분소득와 개인 부채가 높을수록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에 비해 ‘고용·주거·경제 배제형’과 ‘다중배제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용호, 박로사, 2021; Chung et al., 2019; Jose & Cherayi, 2017)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 부채 역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채가 없다는 것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오히려 소비, 소득, 자산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뒤처짐을 의미하며 부채가 있는 가계가 없는 가계보다 더 많은 소득 및 지출,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정운영, 정세은, 2013)와 결과의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의 부채는 이와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 1인가구의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주로 신용대출, 생활비·학자금 대출 등 비자산성 형태를 띠며, 이는 자산 축적 보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재조달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통계청, 2023). 또한 한국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부채 부담이 직업 탐색 행동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부채가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된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다(Choi & Cho, 2024). 본 연구에서도 ‘건강·주거 부분배제형’ 집단은 고용률과 가처분소득이 높았으며, 동시에 개인 부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년층의 개인 부채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이라기보다, 경제활동 및 소득활동과 동반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약하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성별, 교육, 지역, 경제여건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배제 구조의 결과임을 시사한다(Levitas et al., 2007).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취업 및 고용, 주거, 건강 및 의료, 정신건강지원 등의 사업들이 보다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방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은 3개 이상의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특성 띄고 있다. 3가지 유형 중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을 제외한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다중배제형’은 3가지 이상 영역의 배제가 동시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중적 배제 측성은 중·장년기,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신근화, 2013; 장온정, 2022; 최재성, 김혜진, 2019). 이는 청년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빈곤 및 취업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 1인가구의 배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과는 청년 고용 안정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시장 참여정책을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는 청년층 정신건강 바우처 및 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과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명확히 맡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 통합 지원 기구(가칭)’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이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 간 연계 모델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고용 안정 정책이 시행되면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주거 부담이 완화되고, 정신건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촉진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를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양연재, 송인한, 2025). 또한 청년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 운영 확대,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 기반 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Cheung & Yeung, 2021). 이를 구체화한 청년 특화 모델로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마인드케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래 정신건강 치료비를 연 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마인드 톡톡’이라는 찾아가는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도모한다(경기도청년포털, 2024). 해외 사례로는 호주의 ‘headspace’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2006년 설립 이후 12~25세 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108개 센터에서 연간 약 2.4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정신건강 상담·의료· 고용·교육·소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Rickwood et al., 2023). 이러한 모델들은 국내 정책 설계 시 벤치마킹할 만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청년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여 청년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보증금 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정세정, 2020). 특히, 주거 안정성이 정신건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과 정신건강 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김진현, 2021). 추가적으로 청년 1인가구가 겪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상, 정책 시행 이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 시행 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수혜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시행 후 성과는 고용률, 정규직 전환률, 주거 안정성(주거비 감소율,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등), 정신건강 지표(우울감 및 고독감 감소 등),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등 다차원적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 수혜자 대상의 만족도 및 체감도 평가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청년 1인가구가 겪는 복합적인 배제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살펴보면 ‘고용·주거·경제 배제형’과 ‘다중배제형’의 고용 배제 확률 차이와 비교해 경제 배제 확률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거·경제 배제형’에 비해 ‘다중배제형’의 고용 배제 확률이 낮은 것과 상반되게 ‘다중배제형’ 가처분소득의 평균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중배제형’의 청년 1인가구가 근로 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 전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어떤 환경을 마주하는지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이들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격차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업 연장 혹은 취업 연기를 하고 구직행렬로 뛰어들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배제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와 동기 상실, 그리고 결국 정신건강의 어려움까지 초래하기도 한다(안홍순, 2016; 이승윤 외, 2017). 이에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시적 취업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심리·경제적으로 안정적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양산을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우선은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혜택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정주호, 조민효, 2018).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부여되는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 전체 예산 중 20%로 설정된 취약계층 우선 배정 비율을 최소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 빈곤에 직면한 청년 1인가구에게 보다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후 정착률과 장기적 소득 증가 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 대상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 후 6개월간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대상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특정 직종에 편중되거나 훈련 내용이 현실 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박나리, 김교성, 2021). 따라서 청년의 수요에 맞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직종별 맞춤형 훈련을 통해 청년이 실제 취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EU의 Youth Guarantee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15–29세 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에 고용·교육·직업훈련·창업 지원 중 최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약 100억 유로(약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도입 전후 EU 전체 청년 실업률은 평균 4.2%포인트 감소했고, 특히 그리스(−8.5%p), 스페인(−7.3%p) 등 고실업 국가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율이 크게 향상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이러한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도 ‘4개월 취업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신고를 한 청년에게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자리 · 직업훈련 · 창업 지원 중 하나를 반드시 제공하고, 이 과정을 전담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와 지자체 청년 일자리센터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배제 유형별 예측요인을 파악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1인가구의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여 배제 지표를 선정하였으나, 구성된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는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표선정과 측정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제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연속성을 살펴보거나 사회적 배제의 누적을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업 이행기이기도 한 청년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와 학업상태의 변화가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에 포함된 지표가 주거, 고용, 경제, 건강 등 주로 외현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지표로 포착되기 어려운 비가시적 취약성까지 포괄하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청년층의 배제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보다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 여성, 저학력, 실업 등 전통적인 빈곤 가구에서 청년 1인가구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시각을 확정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 , , , . (2020). 2019년도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58
, , , , .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34/1/%EC%97%B0%EA%B5%AC05-10.pdf
. (2006).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72588
, .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대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15446
, .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 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540360
경기도청년포털. (2024).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https://youth.gg.go.kr/gg/archive-policy-search.do?arcNo=582&
. (2015). 15-33 (통권 654 호) 2015.08. 13: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싱글족 (1 인가구) 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젊은층은 주거불안, 고령층은 소득불안 [654], 한국경제주평 [654], 1-1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406790
. (2023. 11. 15). 갈수록 느는 고독사…매년 100명 안팎 청년고독사. 동아경제. https://www.daenews.co.kr/23393
, , , , , , .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35
. (2007b).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03371
. (2014).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사회보장연구, 30(3), 31-5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8184
. (2020). 청년 및 중년 1인가구의 만성질환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자기방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5(3), 325-34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9577
.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0447
, . (2022).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세종: 국토연구원. https://www.krihs.re.kr/gallery.es?mid=a10103090000&bid=0025&act=view&list_no=28004
.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11377
.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11-4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36407
, . (2012).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영국고령화패널 (ELSA) 분석. 한국노년학, 32(4), 1063-10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16768
. (2018. 11. 21). 건강 적신호 켜진 '고단한 청년층'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검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0119000017
. (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17, 49-72.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802365
. (2016). 중장년층의 사회적 배제,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64-92. 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9267
. (2013).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9], 647-6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37029
.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3067
. (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34742
, , , .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99451
, . (2021). 청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3), 91-1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0256
, , , , , .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research&seq=27766
, , .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53332
, , , , , , , , , , , , . (202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opm.go.kr/opm/info/policies.do?mode=view&articleNo=153207
, . (2013). 소득계층별 부채가계의 특성과 결정요인의 비교 부동산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 415-43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95706
.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2053
, , . (2019).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31-62.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88727
, & (1998).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LSE STICERD research paper no. CASE004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158895
, , , , & (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Final report. https://www.ifs.org.uk/docs/odpm_social_exclusion
, , , & (2019).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among older Koreans: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exclu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4, 97-11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205-018-2045-6
European Commission. (2019). Report on PES Implementation of the Youth Guarantee. https://ec.europa.eu/social/BlobServlet?docId=21886&langId=en
(2002).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A European view for a US debate. LSE STICERD Research Paper No. CASE051http://eprints.lse.ac.uk/id/eprint/6430
, , & (2016). The impact of precarious employment on mental health: The case of Italy. Social Science & Medicine, 158, 86-95. [PubMed]
, &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PubMed]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intlr133&div=51&id=&page=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2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7-31

- 873Download
- 2957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