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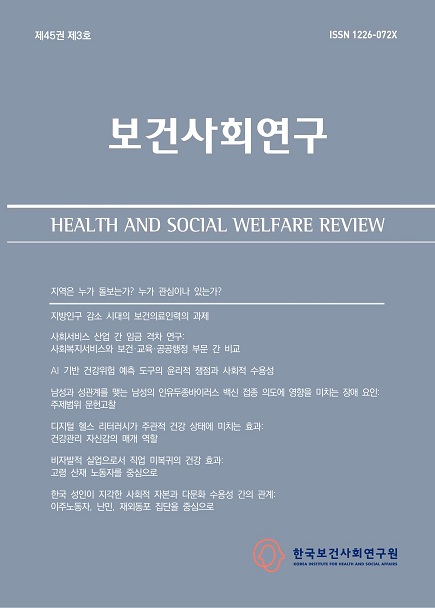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Youth's Mental Health: Focusing o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Ko, Jinsun1; Choi, Ahyoung2*; Hong, Seojoon3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241-264,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24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취업, 소득 등 개인의 경제적 요인에 편중하여 청년의 정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요인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사회자본 이론을 토대로 청년의 개인적 요인(외적·내적)과 사회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개인적 요인 중 경제 수준과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악화시키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요인 중 사회참여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인적 요인에 사회적 요인을 추가했을 때 설명력이 더 높아져, 사회적 요인이 청년 정신건강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지원할 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취미, 여가, 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정보·자원·심리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정서적 지지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정책·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사회 구조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how young adults’ mental health is affected by personal and social factor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survey of individuals aged 20 to 39,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Among personal factors, economic level, life satisfaction, positive emotions, and negative emo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mental health. Among social factor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solation, and social depr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status is an important external factor,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negative emotions are key internal factors,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isolation are critical social factors affecting young adults’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ng adults’ ment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39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개인적 요인 중 경제 수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요인 중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 외적 요인은 경제 수준, 개인 내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 긍·부정 정서, 사회적 요인은 사회 참여, 사회적 고립은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최근 고용 불안정과 실업 문제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의 빈곤, 주거 문제, 삶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면서(이승윤 외, 2016; 백승호 외, 2017; 한승헌 외, 2017; 김정숙, 2018),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고, 30대 청년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이와 함께 조울증, 강박증 유병율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에서 현저하게 높았으며, 자해 및 자살 시도율 역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중장년보다 20-30대의 정신질환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 과도한 성취 압박, 정신건강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며, 그만큼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배경에는 생애주기상 청년기에는 진로를 선택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통한 주거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등 생애 전환과제가 집중되는 시기로,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성은 청년들의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결국 정신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의 증가로 인한 고립·은둔 청년의 확산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더해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기성세대의 개인책임론적 시각은 청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신적 고통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노력지상주의 담론’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은 이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위 및 배경, 능력에 따른 수저담론이 심화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감이 확산되며,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실패 경험이 곧 사회적인 낙인으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자기비난, 자존감 하락, 자기비난,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위기 상황은 청년 정신건강의 문제를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재조명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은 주로 청년의 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이승윤 외, 2016; 김지경, 외, 2018; 이용호, 외, 2023), 청년들의 개인적・심리적 문제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등 실제 청년층의 불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청년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어(강지원, 외, 2023), 노인이나 청소년·아동에 비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행태(김희진, 전희정, 2016; 유선화, 외, 2018; 홍영경, 이무식, 2020), 성별, 교육수준 및 소득 수준, 주거형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조은희 외, 2020), 사회적 신뢰도, 사회 안전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김재우, 2018; 이순주, 강상경, 2021), 아동기 학대 경험, 가족환경, 차별 경험 등 부정적 경험(조혜정, 2020; 김경미, 2021; 박애리, 2021) 등과 같은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동배 외, 2012; 변금선, 이혜원, 2018).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주로 탐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중심의 접근은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나 구조적인 불평등,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정된 접근은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듯 최근 학계에서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개인의 취약성,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통합적 접근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Lin & Guo, 2024; Stepanous et al., 2023).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생물·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물심리사회모델(Askew & Byrne, 2009)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생물,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포괄적이고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김지윤, 조영희 외(2021)의 연구에서 생물심리사회모델에 따라 여자 대학생의 자해경험을 질적 분석한 결과, 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람은 생물학적 요인(정신과적 진단), 심리적 요인(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음주)과 사회적 요인(비수용적인 환경)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성연, 양모현 외(2023)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출간된 15편의 메타 연구에서 확인되는 자살의 위험요인을 생물심리사회모델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자살에 요인 중 가장 높은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우울, 심리적 요인으로는 무망감,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오류, 공격성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또래 관계 스트레스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자본 이론이 있다. 사회자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태적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과와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해준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products)로써, 개인이 다양한 사회환경 수준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질과 특성을 반영한다(Bassani, 2007).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발생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한다고 정의하였다. Bourdieu(1986) 또한 신뢰와 긍정을 기초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Putnam(1995)은 사람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김은지, 전희정, 202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이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우울감이 낮아지고 정신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이를 인지하고 활용할 때 스트레스를 완충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Kawachi & Berkman, 2001).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Brisson & Usher, 2005).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단순한 정신질환의 유무를 넘어 생물학적 취약성과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비대면 소통의 증가로 전통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축소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청년기는 고립과 외로움, 소외, 도움 요청에 대한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지지 유무, 사회적 관계망, 소속감,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단순히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라는 것을 넘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키며 취약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기 특유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 청년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용·소득 등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특정한 심리적 요인 또는 사회적 지지 수준 등 단일 요인에 의존한 분석이 많아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면의 정서 요인과 사회적 관계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사회자본 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개인 내면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고립, 참여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년 정신건강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조적·관계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려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분석 단위를 확장하고, 청년 정신건강을 사회생태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독창성을 갖는다. 나아가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실 기반의 정책적 개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청년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 정신건강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개인의 일상에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웰빙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유무가 아닌 개인의 질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정신건강 또한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적인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정신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20대의 경우, 우울증 환자 수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127%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87%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수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 역시 전체 연령에서의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은 2018년 26%에서 2022년 36%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7만 6,246명에서 2021년 17만 3,745명으로, 4년 사이 무려 45.7% 급증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우울은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증상으로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 청년기는 다양한 발달과업이 요구되며,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거나 직면하는 시기로 발달과 업에 대한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각한 경쟁 사회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을 다른 계층에 비해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청년층의 우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울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빈곤(정병삼, 2021), 소득불평등(김진현, 2021), 고용형태 및 차별경험(정세정, 2016), 사회적 지지(염희정, 한창근, 2022) 등이 있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 막막함은 우울뿐 아니라 불안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우울과 불안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불안의 경우도 우울증처럼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 동반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림, 진땀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서성거림과 같은 이상 행동, 막연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불안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김지경, 2018).
청년의 불안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년의 불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이현주 외, 2020). 통계청(2024) 자료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2023년 46.5% 포인트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청년들은 자신의 교육수준과 전문성에 연결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ILO, 2015).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층의 취업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이현주 외, 2020). 특히, 대학생 등의 청년들은 학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졸업 후 취업이 불확실한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취업실패는 주거 및 생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김수정, 2020; 정병삼, 2021). 청년기에는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민감하며 그에 대한 반응이 불안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G. S. Kim, Y. S. Jeon,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불안이 자살 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최바올 외, 2011)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스트레스 역시 다양한 심리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압박이나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불안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신 외, 2015; 김명숙, 2023; 권영숙, 2023; 문혜주 외, 2024; 이승진 외, 2024). 이와 동시에 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스트레스 반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승혜 외, 2013; Hood et al., 2015). 즉, 스트레스와 불안은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메커니즘 속에서 작용하며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적대감 등과 같이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함께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윤명숙, 이효선, 2011; 강석화, 나동석, 2013; 신미경 외, 2013; 서인균, 이연실, 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대학입학과 더불어 자아정체감 확립 등 중요한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변화를 겪게 되며, 교육환경의 변화, 새로운 대인관계, 독립적인 생활방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창연, 2000; 김경욱, 조윤희, 2011; 황춘희, 2012; Coffman & Gilligan, 2002). 이와 더불어 학업부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등록금 마련, 경쟁 사회, 자기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황성혜, 박종구, 2009) 등 취업을 위해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서인균, 김승희, 2012).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청년들의 자살 위험성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은 여전히 청년층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자해 및 자살 시도자의 약 46.2%가 10대와 20대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20대의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약 19.4%에서 2023년 약 26.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질병관리청, 2023)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2021)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은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과 학력이 낮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수록 자살충동이 더 높았다. 청년층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거주지역, 가구유형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전현규 외, 2015; 윤우석, 2016; 김재우, 2018; 조은희, 이수진 외, 2020), 우울과 스트레스, 문제음주 등과 같은 심리정서학적 요인(최혜금, 이현경, 2016; 변은경 외, 2020; 정인관, 한우재, 2020), 소득, 학력, 경제활동, 실업, 생활고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전소담 외, 2020; 서소영, 2021; 김영범, 2021)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자본, 사회적 배제, 사회적 차별, 주관적 계층인식(송승연, 2016; 김숙향, 황경란, 2016; 선승아, 2021)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까지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에서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청년층의 자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상황으로 시야를 넓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해 사회적 요인에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구조적 원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청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사회자본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정신건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개인적 요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특히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상경(2010)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행동, 스트레스, 그리고 내적·외적 자원 변수들을 통제한 후, 서울 시민들의 자살 태도에 대한 우울감의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뚜렷하다고 보고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직업 유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우울감,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학력, 거주 지역(동/읍면),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 흡연, 문제 음주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정나라 외, 2010). 김선영, 정미영 외(2014) 는 성인 인구를 세 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는 성별, 결혼 여부, 가구 소득, 우울 및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분위 대비 기타 가구 소득과 학력, 경제활동, 규칙적인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라채린과 이현경(2013)은 18세에서 31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중 자살 생각을 연구한 결과 결혼, 소득, 학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망, 스트레스, 그리고 전년도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정은 단순히 거주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개인의 고용 상태, 결혼 여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심리적 불안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정희 외, 2024; Greenop & Alvarez, 2022).
청년의 개인적 요인 중 삶의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안녕감(well-being)을 의미하며, 반복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Diener, 2000). 삶의 만족은 우울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Lee, Lee, 2005), 우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예령, 유지은, 2019). 또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낯선 환경에 적응을 위한 심리적 요인이며, 정신건강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주미, 2024).
즉, 청년의 개인적 요인들은 삶의 만족과 자기효능과 같은 정서와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건강의 보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autam et al., 2024). 자기효능감과 함께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있다(박완주 외, 2020). 회복탄력성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견뎌 나가는 힘을 의미하는데 (김혜인, 박은아, 2025), 회복탄력성의 세부 요인 중 자기통제 능력과 긍정성은 우울,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태형, 이승현, 2023).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년은 낮은 청년들에 비해 자살사고와 우울의 수준이 낮았으며, 정서적 안녕감(well-being)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완주 외, 2020). 더불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지적·행동적 대응 전략은 정신건강의 유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문제 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개인일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민정, 최진아, 2013).
마지막으로, 청년이 채택하는 대처 전략의 유형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긍정적 대처 전략 즉, 사회적 지지 활용, 문제 중심 대처는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회피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처 전략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Oliver et al., 1999). 예컨대, 음주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문제 음주는 정신건강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박아란, 윤명숙, 2024). 특히, 개인적 요인 중 청년들의 취업 여부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이 주로 정신질환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의학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현재는 개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감(well-being)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WHO, 2018)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용하였을 때,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을 느끼며, 고용 불안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전혜옥, 2014; 변금선, 이혜림, 2023).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다양한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백학영, 2013; Lee et al., 2023).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고용상태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신체적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김진현, 2017), 낮은 직업 및 삶의 만족도(임소정, 성백선, 2019), 그리고 물질적 궁핍(Lee et al., 2023) 등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박주영 외, 2016). 또한, 청년층의 고용 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실업이 우울과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et al., 2021).
이처럼 청년의 정신건강은 개인적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요인에 편중되거나 횡단적 접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사회자본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청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나. 사회적 요인
청년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내·외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및 사회적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 낙인, 경쟁적 사회구조, 사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정서적·도구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울 및 자살사고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Ferreira et al., 2020).
선행연구에서 문제음주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 및 가족의 지지 수준에 따라 완화되기도 하며(박아란, 윤명숙, 2024),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보호요인의 존재가 이 영향을 조절함이 밝혀졌다(이정애 외, 2024). 즉,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대인관계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기능과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청년층의 우울감, 외로움,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최하영(2024)은 고시원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반복되는 직장 이직, 주거 불안정, 단절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심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우울감과 삶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은둔 기간이 길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증가하며(박세훈, 배서윤, 2024), 특히 1인가구 청년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적고 고립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이정은, 2025). 또한 ‘청년니트’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직업, 교육, 훈련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참여의 결핍과 고립의 심화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지은주 외, 2024). 또한, 정신건강은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와 상담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문제를 축소하도록 만들게 하며, 치료의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며, 고립과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박지혜, 이선혜, 2022). 특히 경쟁사회에 노출된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Lin & Guo, 2024).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이 인식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은 그 자체로 우울감의 예측요인이며(최광은, 박민진, 2021; 김지향 외, 202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변금선, 이혜림, 2023). 또한 주관적 사회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강해지며,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최광은, 박민진, 2021). 더불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이 제한되어 있어 고립 위험이 더욱 커지며, 이는 다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김진현, 2021). 주거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우울과 무력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고정희 외, 2024).
이처럼 사회적 요인은 청년의 정신건강에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이 아닌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개인 내적 요인을 넘어서서 사회구조와 문화, 지역사회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한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 사회신뢰 4개의 요인은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을 개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타당성과 경험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요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 요인과(외적, 내적) 사회적 요인(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 사회 신뢰)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청년의 개인적 요인(외적, 내적)은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년의 사회적 요인(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 사회 신뢰)은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정의한 청년의 정신건강이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포괄한 개념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진로 결정 과정의 좌절과 압박을 경험하거나, 취업 실패, 경기 불안, 높은 물가 등 예견치 못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정동희 외, 2022; 고진선, 2025).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 외로움과 고립에 노출된 청년들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박동진 외, 2024; 최하영, 2024). 즉, 청년기는 성인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관계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며,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겪는 핵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Lovibond & Lovibond(1995)가 제시한 DASS-21 척도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것으로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주로 병리적 수준의 진단이 아닌 주관적 고통의 수준을 반영하는 구성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만을 가지고 정신건강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해당 요인을 보다 정밀하고 타당하게 측정하고자 우울 척도(CESD-10-D), 불안장애 척도(GAD-7), 스트레스 척도(PSS)를 각각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하였으며, 사전 조사(pilot test) 시 문항 간 상관 계수가 .04 미만으로 나타나 개념적 불일치를 내포한다고 판단하여 우울 2문항을 제외하고 총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통합 측정에 앞서 DASS-21 척도와 각 해당 척도를 활용한 사전 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여 내적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통합 과정에서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들을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재구조화(rescale) 작업 후 역변환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에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도구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969로 나타나 우울 원척도 Cronbach α .86, 불안 원척도 Cronbach α .92, 스트레스 원척도 Cronbach α .83 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나. 독립변수 1: 개인적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개인 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 수준, 취업상태)와 개인 내적 요인(삶의 만족도,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로 설정하였다. 측정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으로 설정되어 부정적 정서와 개념적 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PANAS 척도에서의 부정정서는 분노, 적개심, 죄책감, 긴장 등 광범위한 부정정서를 느낄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질적이고 전반적인 정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정적부적 정서 척도(PANAS)를 활용하였으며, 각 측정 문항은 삶의 만족도 5문항(생활, 생활조건,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등), 긍정적 정서 10문항(재미있는, 고무적인, 힘찬, 확고한 등), 부정적 정서 10문항(화나는, 괴로운, 창피한, 신경질적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도구의 내적 일치도 삶의 만족도 Cronbach α는 .942, 긍정적 정서 Cronbach α는 .930, 부정적 정서 Cronbach α는 .947 나타나 삶의 만족도 원척도 Cronbach α .87, 긍정적 정서 원척도 Cronbach α .84, 부정적 정서 원척도 Cronbach α .87 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다. 독립변수 2: 사회적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요인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 사회 신뢰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참여는 Weiss(1974)의 사회참여 측정 지표 9문항(친목 및 사교, 취미 및 여가활동, 종교, 봉사활동, 이익, 정치, 지역사회 등)를 활용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김하람 외(2021)의 사회적 지지 단축형 척도(PSO-8) 8문항(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사회적 고립 측정은 사회적 관계망 척도 축약본(LSNS-6) 역변환 6문항(친인척 및 친구, 지인, 이웃으로부터 연락, 만남, 도움 제공자, 사적인 대화, 만남 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을 활용하였는데, 통상 LSNS 척도는 가족, 친구로부터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Lubben, 1988).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 척도 축약본(LSNS-6)은 6가지 질문을 역변환하여 사회적 고립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척도로(Lubben, et al, 2006)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이경우 외, 2009; 지민영, 2023), 측정에 활용하였다. 사회 신뢰는 한국행정연구원(2024)의 사회 신뢰 측정 지표 9문항(가족, 이웃, 지인,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 대한 신뢰)을 활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빈도, 사회적 지지도, 고립감,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해당 도구의 내적 일치도 사회적 지지 Cronbach α는 .933, 사회적 고립 Cronbach α는 .934, 사회 신뢰 Cronbach α는 .893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원척도 Cronbach α .96, 사회적 고립 원척도 Cronbach α .83 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한편, 사회참여는 참여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단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3.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자
분석을 위한 모집단은 전국의 20세~39세 청년층이나, 해당 모집단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표집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확률 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표본수집 방식은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텍스트 기반의 비대면 채널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하다는 점,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및 불이익 등의 우려를 회피하여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피력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에서 설문 응답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이영주 외, 2022; 최민재, 이요한, 2022; 고진선, 2025). 실제로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의 주요 포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당사자 커뮤니티 또는 지역별 스터디 모임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당사자 모임 또는 지역별 스터디 모임은 특정 집단의 쏠림으로 인한 표본편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신뢰성의 확보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정신건강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경험 공유가 활발하며, 특정 질환 중심이 아니라 일반 청년층의 관심 기반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인 우리동네마음 건강 연구소를 표본 추출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활용된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리동네마음건강 연구소는 2007년 개설되어 17,300명의 온라인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편중이 없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우리동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본 연구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된 회원 중 20세~39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에 앞서 측정 지표를 검토하고자 사전 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점검하였으며 이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2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응답자는 290명 중 중도 탈락 인원 18명을 제외한 27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윤리 방침에 따라 응답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했으며, 연구진 모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강서대학교 연구윤리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GSUIRB-2025-01).
4. 분석 방법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인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인 정신건강과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청년들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각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해 그 수준을 살펴보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변수인 정신건강과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요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25.0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05명(38.6%), ‘여성’ 167명(61.4%)으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학력의 응답자가 229명(8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명(14.0%), ‘대학원 졸업’ 5명(1.8%) 순으로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100명(36.8%), ‘매우 건강하다’ 95명(34.9%)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하하’~‘하상’의 경우 60명(22%), ‘중’ 132명(48.5%), ‘상하’~‘상상’ 80명(29.4%)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취업’한 청년의 비율을 191명(70.2%), 나머지 29.8%의 청년은 ‘미취업’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 ‘기타’(휴직 등)로 나타났다.
표 1
빈도분석 결과
(단위: %)
| 구분 | 빈도(명) | % | |
|---|---|---|---|
| 성별 | 남성 | 105 | 38.6 |
| 여성 | 167 | 61.4 | |
|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8 | 14.0 |
| 대학교 졸업 | 229 | 84.2 | |
| 대학원 졸업 | 5 | 1.8 | |
|
|
|||
|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하지 않다 | 2 | .7 |
| 건강하지 않다 | 20 | 7.4 | |
| 보통이다 | 55 | 20.2 | |
| 건강하다 | 100 | 36.8 | |
| 매우 건강하다 | 95 | 34.9 | |
|
|
|||
| 경제수준 | 하하 | 8 | 2.9 |
| 하상 | 52 | 19.1 | |
| 중 | 132 | 48.5 | |
| 상하 | 59 | 21.7 | |
| 상상 | 21 | 7.7 | |
|
|
|||
| 취업상태 | 취업 | 191 | 70.2 |
| 미취업 | 56 | 20.6 | |
|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 | 12 | 4.4 | |
| 기타(휴직등) | 13 | 4.8 | |
2.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 변수들의 평균값은 정신건강 1.412,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 4.993, 긍정적 정서 3.607, 부정적 정서 1.941, 사회참여 1.886, 사회적 지지 3.943, 사회적 고립 2.406, 사회 신뢰 2.39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1.475~2.184, 첨도 –1.792~4.73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제변수를 제외한 주요 측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약간의 비대칭성이 발견되었으나 정규분포 허용범위(절댓값 기준 왜도 3, 첨도 10) 내에 분포하여(Kline, 2015) 정규성을 이룬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전체 분석의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 구분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 정신건강 | 0.00 | 3.00 | 1.412 | .740 | 1.080 | .232 | ||
| 개인적 요인 | 외적 | 성별 | .00 | 1.00 | .386 | .488 | .471 | -1.792 |
| 학력 | 1.00 | 5.00 | 3.879 | .379 | -1.248 | 2.543 | ||
| 건강상태 | 1.00 | 5.00 | 3.978 | .956 | -.670 | -.249 | ||
| 경제 수준 | 1.00 | 5.00 | 3.121 | .907 | .146 | -.019 | ||
| 취업상태 | 1.00 | 5.00 | 1.449 | .831 | 2.184 | 4.736 | ||
| 내적 | 삶의 만족도 | 1.00 | 7.00 | 4.993 | 1.448 | -1.155 | .757 | |
| 긍정적 정서 | 1.00 | 5.00 | 3.607 | .895 | -.614 | .001 | ||
| 부정적 정서 | 1.00 | 5.00 | 1.941 | .866 | .977 | -.233 | ||
| 사회적 요인 | 사회참여 | .00 | 8.00 | 1.886 | 1.360 | .598 | 1.121 | |
| 사회적 지지 | 1.00 | 5.00 | 3.943 | .838 | -1.475 | 1.701 | ||
| 사회적 고립 | .00 | 5.00 | 2.406 | 1.037 | .832 | .390 | ||
| 사회 신뢰 | 1.00 | 4.00 | 2.391 | .746 | -.060 | -.859 | ||
3.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정신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면 먼저, 건강상태(r= .488, p<.01), 경제 수준(r= .339, p<.01), 취업상태(r= .394, p<.01), 삶의 만족도(r= .717, p<.01), 긍정적 정서(r= .728, p<.01), 사회참여(r= .407, p<.01), 사회적 지지(r= .697, p<.01), 사회 신뢰(r= .330, p<.01)는 정신건강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정서(r= -.861, p<.01)와 사회적 고립(r= -.507, p<.01)은 정신건강에 부(-)의 상관을 보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 1 | ||||||||||||
| 2) | -.045 | 1 | |||||||||||
| 3) | -.005 | .216** | 1 | ||||||||||
| 4) | -.065 | .129* | .399** | 1 | |||||||||
| 5) | -.028 | -.131* | -.326 ** | -.234** | 1 | ||||||||
| 6) | -.062 | .001 | .488** | .339** | .394** | 1 | |||||||
| 7) | -.011 | .153* | .505** | .562** | .402** | .717** | 1 | ||||||
| 8) | -.053 | .134* | .486** | .520** | .390** | .728** | .820** | 1 | |||||
| 9) | .081 | .034 | -.460** | -.308** | -.337** | -.861** | -.612** | -.649** | 1 | ||||
| 10) | .039 | .080 | .273** | .125* | .239** | .407** | .406** | .439** | -.297** | 1 | |||
| 11) | -.031 | .152* | .559** | .419** | .350** | .697** | .739** | .737** | -.593** | .359** | 1 | ||
| 12) | -.055 | -.015 | -.422** | -.104 | -.255** | -.507** | -.368** | -.435** | .393** | -.247** | -.567** | 1 | |
| 13) | .105 | .098 | .396** | .246** | .075 | .330** | .480** | .450** | -.318** | .393** | .407** | -.179** | 1 |
4. 가설검정
<표 4>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Model 1의 F값은 142.141, p<.001 Model 2의 F값은 108.186, p<.0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고 투입된 모든 변수의 VIF 값은 1.025~4.425로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 Durbin-Watson 값은 1.893으로 1과 3을 초과하지 않아 잔차의 독립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del 1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 투입된 단계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80.6%(R2= .806)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제 수준(β= .082, p<.05)과 삶의 만족도(β= .233, p<.001), 긍정적 정서(β= .150, p<.001)는 정(+)의 영향을, 부정적 정서(β= .608, p<.001)는 정신건강에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부정적인 정서 수준은 높을수록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반면, 경제 수준과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변수 | Model 1(개인적 요인→ 정신건강) | Model 2(사회적 요인→ 정신건강) | |||||||||
|---|---|---|---|---|---|---|---|---|---|---|---|
| B | β | t | 공선성 통계량 | B | β | t | 공선성 통계량 | ||||
| 공차 | VIF | 공차 | VIF | ||||||||
| 개인적 요인 | 성별 | -.015 | -.010 | -.368 | .976 | 1.025 | -.035 | -.023 | -.919 | .936 | 1.068 |
| 학력 | .077 | .040 | 1.402 | .898 | 1.113 | .068 | .035 | 1.350 | .888 | 1.126 | |
| 건강상태 | .034 | .044 | 1.334 | .648 | 1.544 | .012 | .015 | .461 | .544 | 1.840 | |
| 경제 수준 | .066 | .082 | 2.449* | .644 | 1.552 | .056 | .068 | 2.117* | .576 | 1.736 | |
| 취업 상태 | .042 | .047 | 1.572 | .800 | 1.249 | .023 | .025 | .905 | .758 | 1.319 | |
| 삶의 만족도 | .119 | .233 | 4.602*** | .279 | 3.591 | .079 | .155 | 2.998** | .226 | 4.425 | |
| 긍정적 정서 | .124 | .150 | 2.975** | .283 | 3.536 | .069 | .084 | 1.691 | .245 | 4.082 | |
| 부정적 정서 | -.466 | -.608 | -16.052*** | .498 | 2.007 | -.394 | -.514 | -12.990*** | .384 | 2.604 | |
| 사회적 요인 | 사회참여 | .043 | .080 | 2.780** | .726 | 1.377 | |||||
| 사회적 지지 | .055 | .062 | 1.399 | .302 | 3.307 | ||||||
| 사회적 고립 | -.076 | -.107 | -3.357** | .596 | 1.678 | ||||||
| 사회 신뢰 | .036 | -.036 | 1.137 | .605 | 1.652 | ||||||
| F | 142.141*** | 108.186*** | |||||||||
| 수정된 R2 | .806 | .837 | |||||||||
| Durbin-Watson | 1.893 | ||||||||||
둘째, Model 2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 통제된 상태로 사회적 요인이 투입된 단계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83.7%(R2= .837)로 Model 1보다 3.1%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참여(β= .080, p<.001)는 정신건강에 정(+)의 영향을, 사회적 고립(β= -.107, p<.001)은 정신건강에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은 정신건강이 나쁘며, 사회 속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odel 1에서 투입된 개인적 요인들은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설명력과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투입한 Model 2에서의 설명력을 비교했을 때 3.1% 증가하는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외적, 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20~39세 청년 272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외적 요인인 경제 수준은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힌 선행연구(서소영, 2021; 전소담 외, 202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내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는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는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임소정, 성백선, 2019; 이미영, 2024)의 결과를 하위 요인으로 접근하더라도 유의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셋째, 사회적 요인 중 사회참여는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사회적 고립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참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지은주 외, 2024),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최하영, 2024; 박세훈, 배서윤, 2024; 지은주 외, 2024)의 결과와 맥을 함께하여 결과를 지지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이 투입된 Model 2에서의 설명력이 개인적 요인만 투입된 Model 1에 비해 3.1% 증가하여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및 대응은 개인의 심리적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소속감, 상호작용 등 사회적 요인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취약 요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 고립된 생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참여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문화·체육 활동, 청년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참여가 청년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정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즉,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도록 운영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 해야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공론화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제안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천적 접근으로 청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실천과업으로는 청년이 되기 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예비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시간을 의무화하며, 1인 1 동아리 활동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을 포인트제도와 연결하여 실제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고립 및 단절된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체계의 1차 보호망은 가족이며, 사회적 고립 및 단절된 청년들의 문제들도 가족만의 문제라는 관점의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고립 및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안전망을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년 지원시스템에 속한 기관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여 1년 또는 3년 단위로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거나, 지자체 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예산 및 사업의 범위들이 축소되거나 폐쇄되어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제도권 안에서 장기적이고 안정화된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과 비치료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정서적 도움을 받고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이에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기관은 청년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권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는 청년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고, 미술, 요리 등 취미·여가 활동만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비치료적이고 일상적인 형태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확산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1제곱 미터’ 프로그램은 1인 가구 청년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서로 돌보는 형태의 커뮤니티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멘토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후 구성원들의 자발적 욕구로 동아리 활동으로 변모하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온전히 지지해주고 함께 즐기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관계망 확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들을 수행하고 관련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익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코올, 인터넷 중독과 같은 회피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처 전략으로 자신의 우울 불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돕는 보호체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낙인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서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취약성을 보이는 청년들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언론보도 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거나 고립·은둔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온라인 게임 또는 SNS등을 기반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또는 SNS 플랫폼 운영기관들 과 함께 비대면 상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정신건강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체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정신건강 분과를 신설하여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청년들의 지역성, 문화적 요인, 디지털 환경 특성 등도 청년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고위험 청년군(NEET, 장기미취업, 주거취약) 등 특수집단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심층적인 질적 연구와 종단적 패널연구를 후속연구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생물심리사회모델을 이론적 틀로 삼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청년들이 처한 심리사회적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된 틀 안에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다. 그러나 분석 범위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에 국한되면서 생물심리사회모델에서 제시하는 생물학적 요인 또는 수면, 건강인식, 질병 등 신체적 건강 상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나 주거불안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같은 미시적 맥락은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을 포괄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청년층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맥락과 다면적인 전개양상을 구조적으로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의 분석틀이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틀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경제적 요인 중심 접근을 넘어,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사회참여,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요인이 청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환경과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한 개인 심리 문제로 축소하는 기존 접근을 비판하고, 청년층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시도로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사회구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
. (2021). 사망원인통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
, & (2009). Biopsychosocial approach to treating self‐injurious behaviors: An adolescent case stud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2(3), 115-119. [PubMed]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 [PubMed]
, &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PubMed]
, , , , , , & (2006).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The Gerontologist, 46(4), 503-513. [PubMed]
, , , , &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n young adul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5, 1184-1189. [PubMe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Mental health: Strengthening our response.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6-26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8-06

- 975Download
- 658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