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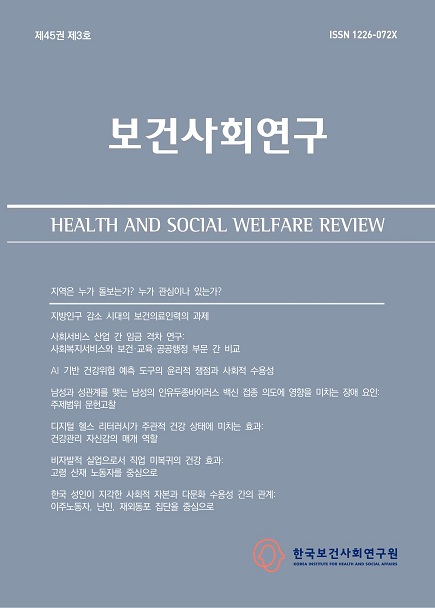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사회서비스 산업 간 임금 격차 연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비교
Wage Differentials Across Social Service Industries: A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Health,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tors
Um, Dawon1*; Jang, Yunseon2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17-42,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1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임금 수준과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월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평균 임금 격차와 분위별 임금 격차 간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단시간 고용, 낮은 직업 위상, 취약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a core segment with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and other sectors including health,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persistent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 prior studies have predominantly relied on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rather than industry-level comparisons, resulting in largely descriptive analyses and limited empirical investigations into wage disparities.
Using the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between 2013 and 2023, we longitudinally analyse trends of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core and other sectors 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was applied to analyse mean wage differentials, while distributional differences were examined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combining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and the Oaxaca-Blinder metho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hourly wage gap has gradually narrowed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gap in monthly earnings has widened. Moreover, changes in the magnitude and structure of wage differentials varied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with shifts in the workforce composition with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ector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policy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the compensation structure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workers in the social service industry.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 핵심 부문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주변 부문인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산업보다는 직종을 중심으로 비교하거나, 임금수준의 실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의 수준과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Oaxaca-Blinder 분해를 사용한 평균 임금 격차를,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결합한 분해방법을 사용해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월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임금 격차의 크기와 구조의 변화는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용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장려되었다. 실제로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는 일자리와 인프라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의 결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성장은 동반하지 못하면서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처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질 낮은 일자리 문제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주로 복지서비스 부문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돌봄종사자들로 대표되는 영역이다. 이 부문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간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부문이다(노기성 외, 2011; 안수란, 하태정, 2022; 김유휘 외,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의 확산, 높은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 때문에 전망있는 일자리로는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이다(백원영, 2023; 안수란, 하태정, 2022). 요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의 화두는 사실상 이 핵심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부문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임금은 전산업 평균 대비 10.4% 낮다(이철선 외, 2023). 직업 측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명목임금은 전산업 평균 대비 72.4% 수준(2018년 기준)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현재 지방이양시설은 공무원 임금의 100.1%(2022년 기준), 국고지원시설은 94.1%(2023년 기준)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23년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4개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임금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이철선 외, 202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핵심 부문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노력이 있어 왔지만,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사실 임금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술적·정책적 주제로 다루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종사자의 저임금은 충분한 서비스의 공급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박세경 외, 2020). 이러한 점에서, 해당 문제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미 수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돌봄종사자를 중심으로 저임금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논의(김형용, 2018; 권덕희, 정세은, 2016; 홍경준, 김사현, 2014)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반에 대한 보수와 처우실태를 제시한 정책연구가 다수를 이룬다(백원영, 2023; 김유휘 외, 2022; 조동희 외, 2021; 김유경 외, 2020; 안수란 외, 2019; 정무성, 2007; 오민수, 2012). 기존 연구들에서는 산업의 특징과 저임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1차 자료 생산을 통해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기된 논의와 다양한 수치들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연구의 한계)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임금 결정요인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격차의 수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통계적 통제없이 단순히 임금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다.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임금 격차를 추정한 연구들 중에는 Oaxaca(1973)의 분해 기법이 활용된 연구가 많다. 이 방식은 임금 결정요인을 투입한 후, 임금차이를 인적 특성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산업 간 차별적인 보상수준의 차이 두 가지로 구분해 낼 수 있다. 즉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하면서, 격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황덕순 외(2012)도 이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산업과 전체 산업의 임금 격차를 분석했지만, 단면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전체 산업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매우 이질적인 산업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비교대상을 선정해 격차의 수준과 구조를 밝혀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는 주로 돌봄종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장지연, 2020; 이주환, 윤자영, 2015; 함선유, 권현지, 2017; 황덕순 외, 2013). 복지서비스 특성상 돌봄 영역이 다수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부문은 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특히 저임금 경향은 특정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용되는 제도나 정책의 규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특정 직무가 아닌 산업 차원의 특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황덕순 외, 2013). 따라서 집계 수준을 높여 산업을 분석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더 유용할 것이다.
셋째, 격차의 수준과 구조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횡단면 분석은 추세적 변화를 논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를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설계와 가장 유사한 접근(김윤영 외, 2019; 황덕순 외, 2013)에서는 특정 시점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데 그쳐, 시간에 따른 격차의 확대나 축소, 격차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 그간 산업에 미친 종사자의 구성변화나 임금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다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저임금 현실을 뒷받침할 실증적 논의는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타 부문 종사자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얼마나 개선되어 왔는지, 격차의 구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상대적 임금수준을 파악할 때는 적절한 비교군의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보건과 교육 그리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을 설정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사회서비스 산업의 핵심 부문이라면,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주변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 내 부문 간 임금 차이를 차별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안수란, 하태정, 2022; 김윤영 외, 2019; 박순우, 이규선, 2015; 황덕순 외, 2012; Dwyer, 201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을 핵심(사회복지서비스업)과 주변(보건·교육·공공행정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산업 간 비교를 통해 임금 격차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서비스 산업의 개념과 구분
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개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규정짓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출발한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일자리 통계에서조차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국가별로도 상당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윤영진,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와 산업구분 방식을 활용해 영역을 구분해 내고, 이를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광의, 협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다(노기성 외, 2011). 광의에서는 일반 사회정책과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상 정의에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정책사업 전반을 아우른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그 중에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최협의의 정의에서는 복지서비스 부문만을 의미한다(노기성 외, 2011).
다양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연구들을 살펴보면, 산업 수준에서 보건과 사회복지로 영역을 한정하거나, 교육과 공공행정까지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김현경, 2024; 문복현, 유일선, 2024; 김영택 외, 2021; 조동희 외, 2021; 장지연, 2020; 김윤영 외, 2019; ILO, 2018; 박수지 외, 2013; 정성미, 2013; 황덕순 외, 2012; 오민수, 2012).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국제연합(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서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전반을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로 공표하고 있다(김유휘 외, 2022; 김윤영 외, 2019).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된다(이재원, 2008).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념의 포괄성을 다르게 설정해 오고 있다(이정은, 2023).
본 연구에서도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을 이러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결부하면, 우선 전체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특정 부문이 갖는 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적 수위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금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해 상대적 차별대우가 존재한다는 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비교군의 설정은 임금 차별에 대한 주장이 단순히 어느 집단의 일반적이며 자기이해와 관련된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다(김형용, 2018). 사회서비스 산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존재는, 그 내부의 부문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식별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 사회서비스 산업의 핵심 부문과 주변 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성질로 보면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범주의 정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최협의의 사회서비스로 정의된 범주를 사회서비스의 핵심 부문으로, 보다 넓은 범주로 정의된 영역을 주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별도의 이론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범주로 정의된 사회서비스 영역 중에서 저임금의 현상은 특정 부문, 즉 최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임금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 부문 간에는 일정수준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논의에서 이렇게 부문 간 경계를 짓는 것은 정책적 개입을 논의하기 위해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제시된 바 있다. 안수란과 하태정(2021)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관련성’의 정도를 가지고 모집단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 핵심 부문은 사회서비스의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며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안수란과 하태정(2022)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을 구분해 보면 크게 ‘주요 산업군’과 ‘연관 산업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요 산업군은 다시 ‘핵심 산업군’과 ‘주변 산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산업군의 핵심 산업군의 경우 100% 사회서비스 사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산업군이며, 이들은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주변 산업군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공공 부문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서비스 분야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산업군이다. 마지막으로 연관 산업군은 100% 사회서비스 산업체로 간주될 수 없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들로 구성된 산업 범주를 의미한다. 앞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되는 것처럼, 개념적 범위로 포괄하는 산업군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활용해 백원영(2023)의 연구에서도 사회서비스 산업을 핵심과 연관 산업으로 구분해 두 산업군에서의 여성 비율, 종사상 지위의 비율, 월 평균 임금, 직종 분포 등의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결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개념 정의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며, 이 중 핵심 부문은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앞서 언급한 저임금이 고착화된 대표적인 부문이다. 다음으로 관련성이 덜하지만 가까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주변 부문이 존재한다. 보건, 교육, 공공행정 등은 사회서비스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핵심성과 밀접도 측면에서는 주변부에 해당한다. 국가 간 비교를 포함한 일부 연구에서는 보건업을 핵심 부문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실태에 주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상체계가 안정적인 보건 영역은 복지서비스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 간 유사성보다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정의와 범주의 기준에서 출발하며,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의해 규제받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특성
가. 낮은 산업 생산성과 서비스 수요자의 경제적 취약성
일반적으로 산업의 임금평균이 높으려면 해당 산업의 높은 생산성과 이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 일자리의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윤영 외, 2019). 서비스업 자체가 기술 발전이 힘들고 노동집약적이라 생산성이 낮다고 여겨진다(Baumol, 1967). 만일 동일한 서비스 산업이라도 노동이 그 자체로 산출물의 질을 결정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그대로 단위당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를 서비스 수요자나 다른 주체(가령 국가)가 감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홍경준, 김사현, 2014).
사회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느린 특징을 지닌다(김형용, 2018). 특히 돌봄노동은 직무 특성 때문에 기술 대체로 생산성을 증진하기가 더 어렵다(신영민, 김태일, 2022). 더 중요한 측면으로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화를 통해 쉽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미취업자 및 빈곤층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높은 비용과 이윤을 책정하기 힘들다. 결국 정부나 지역사회의 비용보조가 상당 수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이후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정부에 의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다(윤정향, 2021). 복지서비스 제공의 보편성이 확대될수록, 정부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제공인력의 임금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 다수의 이차 노동시장 종사자
이중 노동시장(혹은 분절적 노동시장) 가설은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방식, 보상, 대표성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설명한다(Doeringer & Piore, 1971). 대표적으로 일차와 이차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등으로 나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별이나 고용형태, 학력, 기업규모, 공공과 민간부문 등에 따른 분절된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 특정 조건은 내외부간 경계를 만들어내고 열등 부문에서는 다른 임금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Wachter et al. 1974). 물론 이차 노동시장 이론의 핵심은 이중구조화된(혹은 분절된) 노동시장이 가진 위계성과 폐쇄성 구조에 있긴 하지만, 이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것만으로 일차 노동시장과는 다른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불이익(wage penalty)이 존재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경우 상당수의 종사자가 하위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권현지 외, 2015). 복지서비스 부문은 직업군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이 높다(안수란 외, 2022; 정성미, 2013). 낮은 일자리 안정성 때문에 오래 일하기도 어렵다. 사회서비스 직종별 근속기간을 분석한 김유휘 외(2022)는, 간호사의 경우 86.9개월, 유치원 교사 71.4개월,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가 60.2개월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각각 53.2개월, 40.9개월로 매우 낮은 근속기간을 보였다. 학력 역시, 교육업과 보건업은 여성 종사자의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라 학력이 높고, 반면 복지서비스업은 낮은 학력을 보인다(이주환, 윤자영, 2015; 정성미, 2013).
다. 높은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 비율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특히 돌봄노동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윤자영 외, 2011; England, 2005). 돌봄노동은 역설적이게도, 문화적으로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것으로 존중받는 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비용지불은 부정된다(England et al., 2002).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돌봄이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 왔고 여성이 하는 비공식 노동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래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해 온 일을 ‘당연한 역할’로 간주해온 성차별적 사회통념은 가치절하를 초래해 왔으며, 이것이 결국 저임금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England et al., 2002).
실제로 여성이 다수 진출하는 사회서비스나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저소득화 경향이 나타난다(권덕희, 정세은, 2016). 복지서비스 부문에 돌봄 직종 중심의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낮은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이탈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선택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권현정 외, 2018). 또한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도입이나 2008년 장기요양제도와 같은 비교적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주로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확대하여 왔다. 이 때문에 복지서비스 부문은 보건이나 교육, 공공행정과 같은 주변 부문에 비해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2012년 기준, 여성의 비율은 86.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여성 비율인 4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황덕순 외, 2013). 높은 돌봄노동과 여성 종사자 비중은 저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의료복지서비스직 같은 경우 중고령 여성근로자의 막다른 일자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황덕순 외, 2013), 사실상 임금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라. 미숙한 보상체계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임금 보상은 산업 간 제도 구조 및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Kilbourne et al., 1994). 만일 자격 조건이나 교육과정이 느슨할 경우 사회적 인정이나 협상력을 낮춰 보상수준을 낮추게 된다.1) 동일한 자격이라도 공공 또는 민간부문 어느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를 수도 있다.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라도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순우, 이규선, 2015). 과거의 서비스직은 산업과 상관없이 비슷한 임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IT산업에 속하는 서비스직은 높은 보상을 얻는 반면 전통 제조업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된다(Haltiwanger & Spletzer, 2020).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은 자격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백원영, 2023). 하지만 핵심 부문과 주변 부문을 구분해 보면 명백한 보상체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건업은 의료관련 면허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업 역시 엄격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역시 직급별 호봉제를 근간으로 정형화된 임금체계가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경우 보상체계가 취약하다.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오랜기간 비공식(사적)영역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화 되었을 때 제도화된 기준이나 고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절한 상품화가 수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을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관련 전문직은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직업 자체 때문보다는 산업의 부(-)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황덕순 외, 2013). 돌봄일자리의 경우도 비슷한 학력이라도 보상수준이 다른 직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윤자영 외, 2011).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른 인정체계 역시도 부족한 실정이다(권현정, 홍경준, 2017; 김윤영 외, 2019). 미숙한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회복지노동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오고 있다.
마. 민간위탁과 보조금 의존적인 공급 체계
사회서비스 공급의 아웃소싱 구조와 그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 역시 저임금과 연관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제약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간에 대한 기관위탁과 위탁 기관 운영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조금의 크기도 서비스 성과보다는 시설규모나 직원 수로 결정되었다(노기성 외, 2011).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작은 규모의 공급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급구조를 만들었다(양난주, 2016).
국가 재정에 강하게 의존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사정상 종사자에게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할 여력은 취약하다. 제공기관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의 예산 압박이 커지면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부문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종사자의 임금도 통제를 받게 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따라서 종사자 처우에 대한 미흡한 기준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유경 외, 2020).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도 시설규모가 작으면 승진적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오민수, 2012). 더해서, 지금과 같이 제공기관이 수탁인으로부터 확정된 예산만 받는, 일종의 간접고용의 형태가 지속되면 기관장은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김형용, 2018).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된 서비스 단가 내에서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사실상 시설장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임금이 책정되다 보니, 종사자는 낮은 수가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및 변수 조작화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분석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3~2023년 원 자료를 사용했다.2) 이 자료는 전국 23만1천 표본가구(2023년 기준)내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개인의 인적특성과 일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 직장(일) 특성 및 산업 중분류 특성을 제공한다. 일에 관한 사항에는 부업여부나 노동시간 관련 질문을 포함하며, 직장 특성은 사업체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근속 기간, 월 평균임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 중분류와 지역변수 활용을 위해 ‘하반기 C형’을 활용했고, 분석 전체기간의 ‘직장 종사자 규모’ 변수의 활용을 위해 원격접근서비스(RAS)를 신청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집단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다수 표본을 가진 패널조사라도 산업 중분류 수준이 되면 적은 표본 때문에 임금 격차 분석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추세 파악을 위해 안정적인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 자료가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3)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0차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업(87)’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을 분석대상 산업으로 선별했다. 분석은 18~69세의 현재 취업중인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업을 겸하고 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극단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주요 변수 및 조작화 방식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표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경우 2013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활용해 실질임금으로 변환 후 로그를 취하였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의 질문을 활용해, 월평균 임금을 주당 근로시간×4.3으로 나누어 구하였다.4)
표 1
주요 변수 및 조작화
| 변수명 | 조작화 방법 | 변수명 | 조작화 방법 |
|---|---|---|---|
| 로그실질시간당임금, 로그실질월임금1) | 연속변수 | 근속개월 수, 근속개월 수 제곱 |
연속변수 |
| 성별 | 여성=1, 남성=0 | 근로시간 | 연속변수 |
| 연령, 연령 제곱 | 연속변수 | 근무지역3) | 수도권=1, 비수도권=0 |
| 배우자 유무 | 유배우자=1, 미혼·사별·이혼=0 | 직종 | 관리직및전문가(ref.)=1, 사무직=2, 서비스·판매직=3, 기능조작조립직=4, 단순노무직=5 |
| 교육수준 | 중졸이하(ref.)=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학원이상=5 | 직장규모 | 1~4명(ref.)=1, 5~9명=2, 10~29명=3, 30~99명=4, 100~299명=5, 300명 이상=6 |
| 비정규직 여부2) | 비정규직=1, 정규직=0 |
주:
-
1) 실질임금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의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https://kosis.kr/index/index.do
-
2)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과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정규직, 나머지는 비정규직임.
-
3)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수도권, 나머지는 비수도권임.
독립변수의 경우 교육수준, 직종, 직장 규모는 범주형 변수로, 나머지 성별, 연령(및 연령 제곱), 배우자 유무, 비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근속개월 수(및 근속개월 수 제곱), 근무지역(수도권 여부)은 연속형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직접 질문을 통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와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를 활용해 새로 조작화하였다. 즉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과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정규직, 나머지를 비정규직으로 조작화 하였다.5)
분석은 평균 임금 격차와 분위별 임금 격차를 구분해 실시했다. 평균 임금 격차 분석에는 Oaxaca-Blinder(이하 ‘OB’) 분해 방법을, 분위별 임금 격차 분석에는 Firpo et al.(2009)가 제시한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UQR)에 기반한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가. 평균 임금 격차 분해: OB 격차 분해
OB 임금 격차 분해는 Oaxaca(1973)와 Blinder(1973) 등을 통해 임금 격차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격차에서 인적자본 수준과 같은 변수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변수의 값으로 설명되지 않는, 즉 차별 등의 원인 때문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임금 격차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추정방식은, 우선 비교하고자 하는 OLS를 사용해 A,B 각 집단의 임금결정 방정식의 회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한 후(이때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임금함수(식 1,2)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위의 식 (1,2)를 가지고 아래 식(3)과 같이 재구조화한다. 이때 변수 벡터의 기댓값은 각 표본평균값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 중 A,B가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즉 가상적(counterfactual) 임금수준의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나머지 격차의 비중을 계산해 낸다. 이렇게 도출된 식(3)에서 우변의 값이 ‘설명되는(explained) 격차’이며, 값이 ‘설명되지 않는(unexplained) 격차’로 취급된다. 즉 첫 번째 항은 집단 A와 B의 특성 차이로 인해 설명되는 격차이며, 두 번째 항은 집단 A와 B의 회귀계수 차이, 즉 임금보상 구조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적용하면,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A)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B)의 평균 임금 격차는 종사자간 특성 벡터 차이에 A부문의 단위당 보상수준을 곱한 ‘설명되는 부분’과, 부문 간 보상차이에 B부문의 특성 벡터를 곱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게 된다.
나.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 재중심영향함수 x OB 분해
OB 분해방식을 활용한 평균임금 격차는, 일반최소자승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임금 격차를 분해하는데 거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체 임금의 분포, 즉 상위(고소득층)와 하위(저소득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의 임금 격차 연구들에서는 격차분해를 분위별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위별 격차를 따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조건부 분위회귀(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조건부 분위회귀는 각 분위에서 개인들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Koenker, R., & Basset, G., 1978, 장진희, 202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분위별로 독립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치가 도출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가 분위별로 달라 분위별 비교에 한계가 있다. 즉, 조건부 분위회귀 결과는 특정 분위수에서의 조건부 관계를 반영할 뿐이며, 전체 분포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를 일관되게 비교하기 어렵고 분위간 차이나 변화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Firpo et al.(2009)이 고안한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Firpo et al.(2009)는 조건분포 제약을 두지 않는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활용한 무조건부 분위회귀 방식(UQR)을 제안했다. 무조건부 분위회귀는 앞서 조건부 회귀분석의 방식처럼 변수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분포를 활용한다. 즉 어떤 변수가 특정 분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닌, 전체 분포에서의 해당 분위값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RIF 회귀식은 일반적인 회귀식과 유사하지만, 종속변수로 변수 통계량의 RIF값을 활용한다.7) 분위 τ의 분위수에 대한 재중심영향함수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τ는 종속변수 Y의 분포에 대한 τ분위값을 의미한다. ID(·)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종속변수 개별 관측치인 Y가 qτ보다 작거나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fY (qτ)는 종속변수의 τ분위에서 의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 무조건부 분위회귀에서는 이러한 함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최소자승추정법을 활용해 분위별로 영향을 추정한다. 각 분위수 qτ가 더해져 관측치마다 RIF 값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커널밀도함수를 사용해 분위수 근방의 밀도를 계산해 내어(fY (qτ)), 영향력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런 과정으로 개별 관측치에 대한 재중심영향함수를 추정해 내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RIF를 기반으로 하는 분위회귀분석이 수행된다. 아래 식(2)에서 추정계수 βτ는 설명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무조건 분위수 q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RIF를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으로 추정된 분위회귀 결과에 OB 분해 방식을 적용한다.8)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평균 격차에 대해 적용하는 OB의 해석방식과 동일해 진다(Rios-Avila, 2020). 각 분위(τ)에서의 격차 는 아래의 식(3)의 우변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우변 첫째항( )은 앞서 OB 분해와 같이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인 구성효과의 크기이고, 둘째항( )은 보상차이로 나타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구조효과를 의미한다.
Ⅳ. 분석 결과
1. 집단의 기초 특성
[그림 1]은 실질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의 분포를 나타낸다. 두 부문의 임금 분포의 이질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저임금대에서 집중도가 매우 높은데, 월 임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실질 시간당 임금, 실질 월 임금 분포
(단위: 원, 만 원)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을 토대로 2013~2023년을 통합한 임금 분포임.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표 2>에서는 연도별 실질임금의 변화와 임금상승률, 두 부문 간 격차를 나타낸다. 먼저 시간당 임금의 경우, 2013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임금 평균은 보건·교육·공공행정의 54.7%의 수준이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임금상승이 더 컸기 때문에 2023년에는 63.8% 수준까지 격차가 감소했다. 임금은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높게 상승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컸던 시기로, 전반적인 임금 향상의 혜택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임금 격차의 감소세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주춤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월 임금의 경우, 2013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임금 평균이 보건·교육·공공 행정의 52.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54.0% 수준까지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인 추세는 시간당 임금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시기 월 임금의 감소가 다소 뚜렷하다.
표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실질임금 및 임금상승률
(단위: 원, 만 원, %)
| 변수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시간당임금 | 보건·교육·공공행정(A) | 14,276 | 14,526 | 14,850 | 15,278 | 15,397 | 15,909 | 16,549 | 16,354 | 17,419 | 17,757 | 16,472 | |
| 임금 상승률 | - | 1.8 | 2.2 | 2.9 | 0.8 | 3.3 | 4.0 | -1.2 | 6.5 | 1.9 | -7.2 | ||
| 사회복지서비스(B) | 7,810 | 7,999 | 8,413 | 8,588 | 8,802 | 9,488 | 10,268 | 10,415 | 10,765 | 11,145 | 10,502 | ||
| 임금 상승률 | - | 2.4 | 5.2 | 2.1 | 2.5 | 7.8 | 8.2 | 1.4 | 3.4 | 3.5 | -5.8 | ||
| B/A | 54.7 | 55.1 | 56.7 | 56.2 | 57.2 | 59.6 | 62.0 | 63.7 | 61.8 | 62.8 | 63.8 | ||
| 월임금 | 보건·교육·공공행정(A) | 249.4 | 248.0 | 251.4 | 260.6 | 260.5 | 266.8 | 275.0 | 268.5 | 271.9 | 269.0 | 271.1 | |
| - | -0.6 | 1.3 | 3.7 | 0.0 | 2.4 | 3.1 | -2.4 | 1.3 | -1.1 | 0.8 | |||
| 사회복지서비스(B) | 130.0 | 129.1 | 133.2 | 136.1 | 135.9 | 140.1 | 148.8 | 149.3 | 148.2 | 147.4 | 146.4 | ||
| 임금 상승률 | - | -0.7 | 3.2 | 2.1 | -0.1 | 3.1 | 6.2 | 0.3 | -0.7 | -0.5 | -0.7 | ||
| B/A | 52.1 | 52.1 | 53.0 | 52.2 | 52.2 | 52.5 | 54.1 | 55.6 | 54.5 | 54.8 | 54.0 | ||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다음으로 [그림 2]는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김유휘 외(2022)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와 핵심, 연관 산업군의 종사자 수 증가를 보여주는데, 특히 핵심 산업군에 속한 근로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도 유사한 표본 수의 증가세가 나타난다.
그림 2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주: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김유휘 외(2022, p.29)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개선 연구’, <표 2-4> 수치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하였음. 여기서 핵심 산업군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를 의미함.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주요 변수의 통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비율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경우 2013년 59.7%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2023년 63.6%를 나타낸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2013년 87.9%에서 2023년 88.7%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평균연령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2013년 40.1세에서 2023년 42.1세로 소폭 상승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43.0세에서 51.6세로 크게 상승하였다. 교육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큰 변화는 없고 2021년 이후 대졸자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른 학력보다 대졸자 비율이 40%대 이상을 유지해 왔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고졸자의 비중이 30%대로 가장 높고, 지난 10년새 중졸·고졸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었지만(황덕순 외, 2013) 지난 10년간 저학력자 위주로 고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2013년 40.4시간에서 2023년 38.1시간으로 소폭 감소했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38.5시간에서 31.7시간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단시간 근로 일자리의 증가가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속개월의 경우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2013년 97.2개월에서 2023년 99.6개월로 다소 증가했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37.5개월에서 44.7개월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타 부문의 절반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2013년 31.0%에서 2023년 25.2%로 크게 낮아진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44.8%에서 49.7%로 오히려 증가했다. 직종의 경우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코로나19 시기의 약간의 변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체로 관리직 및 전문가의 비중이 40% 후반대로 높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20%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2013년 관리직 및 전문가의 비중이 48.0%로 높았지만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해 2023년에는 30.5%까지 떨어졌고, 반면 서비스·판매직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3년에 51.4%를 나타냈다.
직장이 수도권에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48.1%에서 43.1%로 감소하였다. 직장 규모의 경우도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은 큰 변화가 없었다. 30~99명 규모의 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평균적으로 약 3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직장규모가 9명 이하인 비중은 줄고 10~29명, 30~99명 규모인 경우가 꾸준히 증가했다. 영세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모화 정책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함선유 외, 2024).
그림 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특성 변화
(단위: %)
주: 로그를 적용한 실질 시간당 임금, 실질 월 임금이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2. 평균 임금 격차의 변화
[그림 4]는 OB 분해방식을 통해 추정된 임금의 차이와, 그것의 변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구성효과)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구조효과)의 비중을 식별한 결과이다.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을 따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보상수준의 변화와 종사자 분포 변화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해석하고자 한다. 시간당 임금은 각 변수에 대한 수익률의 합이기 때문에 임금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월 임금은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합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변화라는 중요한 요인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임금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현경, 2024). 분석 결과에서도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은 다소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언급한 것처럼, 종속변수가 월 임금인 경우 단시간근로 같은 종사자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4
연도별 평균 임금 격차 및 설명되는 차이·설명되지 않는 차이 비중
주: 로그를 적용한 실질 시간당 임금, 실질 월 임금이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시간당 임금의 경우, 격차는 2013년 0.5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39 수준으로 감소했다. 로그가 취해진 이 수치를 비율로 변환해 해석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타 사회서비스 부문에 비해 2013년 58.9% 수준에서 2023년 67.7% 수준으로 임금이 상승해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표 2>의 단순 평균값과 비교해 통제변수의 영향으로 추정된 결과에서는 임금의 격차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황덕순 외, 2013)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약 36%(2012년 기준)의 임금 격차가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특히 여성·고학력·중장년 중심으로 증가하기도 했고(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복지서비스 부문의 처우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이 반영된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월 임금의 경우, 격차가 유지돼 오다가 2018~2020년 사이 감소하였고, 다시 증가하여 2013년 0.59과 비교해 2023년 0.62 수준으로 벌어졌다. 비율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평균 임금은 2013년 62.4% 수준에서 2023년 59.3%으로 감소한 것이다. 두 부문 모두 2020년 이후부터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격차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의 경우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비중은 2013년 64.2%에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다시 감소해 63.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월 임금의 경우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은 2013년 71.0%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월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에서 변수의 평균 차이가 커지면서 설명가능한 부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는 [그림 4]의 로그실질임금, 로그실질임금 격차, 설명되는 차이와 설명되지 않은 차이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에 따라 변화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가장 큰 차이는 구성효과의 크기 변화인데, 시간당 임금은 줄어 들고 있지만 월 임금은 커지고 있다. 시간당임금의 경우, 앞서 [그림 3]의 집단간 특성 격차가 커지는 변수들이 더 많은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집단간 특성 차이가 커지더라도, 임금 격차에서 구성효과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다. 구성효과의 크기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XA - XB)에 기준 집단의 계수( )가 곱해지는 형태인데, 이때 계수의 크기에 따라서도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의 평균적 특성 차이가 커지더라도 기준집단의 계수크기가 작아지면 구성효과는 작아질 수 있다.9) 실제로 기준 집단인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에 대한 매년 OLS 결과에서 계수를 추출해보면, [그림 5]와 같이 계수의 크기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성효과의 감소는 종사자의 특성차이 감소보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각 변수의 보상이 줄어든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과 달리 격차가 확대되었고, 따라서 두 집단의 관찰된 특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구성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
두 부문에서의 임금 격차 연도별 요인분해
(단위: 원, %)
| 변수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시간당임금 | 보건·교육·공공행정 | 9.40 | 9.43 | 9.45 | 9.48 | 9.49 | 9.54 | 9.58 | 9.57 | 9.63 | 9.66 | 9.60 | |
| 사회복지서비스 | 8.88 | 8.90 | 8.95 | 8.98 | 9.01 | 9.09 | 9.18 | 9.19 | 9.23 | 9.26 | 9.20 | ||
| 임금 격차 | 0.53 | 0.53 | 0.50 | 0.50 | 0.48 | 0.45 | 0.40 | 0.38 | 0.41 | 0.41 | 0.39 | ||
| 설명되는 차이 (비중) | 0.34 (64.2) | 0.32 (61.0) | 0.32 (63.6) | 0.34 (66.9) | 0.32 (66.1) | 0.30 (66.5) | 0.28 (69.2) | 0.26 (69.8) | 0.28 (68.0) | 0.26 (63.7) | 0.25 (63.4) | ||
| 설명되지 않는 차이 (비중) | 0.19 (35.8) | 0.21 (39.0) | 0.18 (36.7) | 0.17 (33.1) | 0.16 (33.9) | 0.15 (33.5) | 0.12 (30.8) | 0.11 (30.2) | 0.13 (32.0) | 0.15 (36.3) | 0.14 (36.6) | ||
| 월 임금 | 보건·교육·공공행정 | 14.52 | 14.51 | 14.53 | 14.57 | 14.57 | 14.61 | 14.63 | 14.61 | 14.63 | 14.64 | 14.65 | |
| 사회복지서비스 | 13.93 | 13.92 | 13.94 | 13.96 | 13.97 | 13.99 | 14.06 | 14.06 | 14.04 | 14.03 | 14.02 | ||
| 임금 격차 | 0.59 | 0.59 | 0.59 | 0.61 | 0.59 | 0.61 | 0.58 | 0.55 | 0.58 | 0.60 | 0.62 | ||
| 설명되는 차이 (비중) | 0.42 (71.0) | 0.42 (70.6) | 0.42 (72.1) | 0.47 (76.9) | 0.47 (78.5) | 0.49 (79.2) | 0.49 (83.9) | 0.46 (84.3) | 0.48 (82.5) | 0.48 (79.0) | 0.51 (82.1) | ||
| 설명되지 않는 차이 (비중) | 0.17 (29.0) | 0.17 (29.4) | 0.16 (27.9) | 0.14 (23.1) | 0.13 (21.5) | 0.13 (20.8) | 0.09 (16.1) | 0.09 (15.7) | 0.10 (17.5) | 0.13 (21.0) | 0.11 (17.9) | ||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그림 5
기준 집단(보건·교육·공공행정) OLS 계수 크기의 변화
주: 연도별 OLS 추정결과에서 각 변수의 계수이다. 2013년~2023년간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두 시점만 비교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한 효과를 나타내며, 기준집단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보상임금의 관점(시간당 임금)에서 두 부문의 임금 격차는 줄고 있다. 격차의 축소는 구성효과와 구조효과가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전반적으로 두 부문의 특성차이가 커져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변수에 대한 보상(계수의 영향)의 감소와 직장 규모의 확대, 여성 종사자 비율 차이의 감소와 같은 요인이 상쇄되어, 구성효과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월 임금의 경우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여기에는 두 집단간 특성차이가 크게 반영되어, 구성효과는 커지고 구조효과는 시간당 임금과 같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분위별 임금 격차의 변화
여기서는 임금 격차를 분위별로 살펴본다. 평균 임금 격차는 집단의 임금 분포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1]처럼 분포의 형태가 크게 다르면 특정 분위에서의 격차의 크기와 구조 역시 다를 수 있다. 이미 평균 임금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위별로 나타나는 좀 더 복합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그림 6]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그림 6
연도별 임금 분해 및 격차: 시간당 임금
주: 로그를 적용한 실질 시간당 임금, 실질 월 임금이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첫째, 임금 격차의 수준은 고임금층일수록 크다. 가장 낮은 임금대인 10분위의 경우, 지난 10년간 복지서비스 부문은 74.8~81.9% 수준의 임금을 받아 왔지만(격차: 25.2~18.1%), 가장 높은 임금대인 90분위에서는 44.9~55.4% 수준의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격차: 55.1~44.6%). 일반적으로 고임금층에서는 노동의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이 커 임금 격차가 클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저임금층에 집중된 경우와 고르게 분포된 경우에도 상위로 갈수록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분위별 임금 격차의 추세가 다르다.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하위부터 중위분위까지의 감소 추세보다 상위에서의 감소 폭이 더 크다. 다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10분위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하위임금대에서 격차는 오히려 줄거나 유지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하위임금에는 저숙련, 비정형 고용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비공식 노동 등의 영향도 존재해 적정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예상컨대,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영향을 더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시기가 격차 확대에 미친 영향이 감지된다. 하위부터 중위임금까지의 격차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가 심화된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론 인과적 설명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앞선 시기의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제도적, 정책적 요인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역전은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보건의료나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방역으로 인해 초과근무나 주말근무 등 업무가 증가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대면·현장서비스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중단·축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가 주로 이뤄지는 영역에서의 수입이 더 감소했을 것이다. 상위임금인 80·90분위에서 추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 해당 분위에 위치한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격차의 구조적 측면에서 하위분위일수록 대부분은 구성효과, 즉 종사자 간 특성차이로 설명된다. [그림 6]을 보면 중위임금층까지는 회색선(임금 격차)과 노란선(구성효과의 크기)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격차의 대부분을 구성효과가 차지한다는 뜻이다. 상위임금(70분위 이상)으로 가면서 설명되지 않는, 즉 구조 효과의 영향이 커진다. 상위임금층에서는 특성차이가 크지 않고, 대신 산업이 지닌 생산성이나 보상체계 등 설명되지 않는 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80분위에서는 구조효과가 구성효과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고, 최고임금층인 90분위에서는 압도적으로 커진다. 가장 높은임금을 받는 종사자 사이에서는 동일한 인적특성을 갖췄더라도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면 30.9%(2023년 기준, 구조효과) 더 적게 받는다. 임금 하위에서는 인적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요인이,10) 임금 상위에서는 산업 임금 프리미엄과 같은 설명되지 않는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지난 10년간 격차의 감소는 주로 구조효과의 감소가 견인하였다. 특히 중위임금부터 상위임금층까지 격차의 변화는 구조효과의 변화 모습과 크게 일치한다. 구성효과는 큰 변화가 없거나 일부 소폭 상승하기도 했기 때문에 감소세는 산업 간 구조효과 감소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 간 임금 격차의 확대가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industry premium)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우려(이종하, 오삼일, 2023)의 측면에서 보면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월 임금을 살펴보자. 시간당 임금과 비교해 변화과정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시간당임금 격차와 비교를 통해 월 임금 격차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임금 격차는 고임금층에서 크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오히려 저임금층에서 격차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영향이 크고, 이들은 주로 하위임금층에 위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분위에서는 2013년 0.47이었 던 격차가 2023년 0.92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임금은 타 부문의 62.5% 수준에서 39.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격차: 37.5~60.1%).
둘째, 분위별 임금 격차의 추세가 다른데, 시간당 임금과 비교해 하위분위에서 격차의 증가세가 더 뚜렷하고, 중위분위 에서는 감소세가 완만하며, 상위분위에서는 감소세가 명확해진다. 월 소득에서 보면 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양극화 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간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저소득에서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중위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뚜렷하지 않다. 다만 앞서 시간당 임금 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그 경향성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 하위부터 중위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강화시켰다고 추측된다.
넷째, 하위분위일수록 구성효과가 격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10분위에서는 안정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10분위부터 30분위까지 격차 중 구성효과의 비중은 일정하지 않으며 구조효과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중위임금을 중심으로 구성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80·90분 위에서는 구조효과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섯째, 상위분위에서의 격차의 감소와 하위분위에서의 격차의 증가는 모두 구조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경향성은 시간당 임금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하위분위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림 7
연도별 임금 분해 및 격차: 월 임금
주: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3-2023,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위의 분석 결과와 더불어 한 가지 시사점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OB 분해를 활용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구조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격차 중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차별이나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극복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간 인적구성의 차이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산업 간 임금 격차에 서 구성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정책적으로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함의를 준다. 특히 저임금층에서 구성효과의 비중 변화는, 향후 사회서비스 핵심 부문의 정책 방향 설정에 단서를 제공한다.
Ⅴ. 결론
사회서비스 산업 핵심 부문의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타 부문과 비교해 얼마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가? 임금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2013~2023년간 임금 격차의 변화를 장기적 추세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주요 발견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복지서비스 부문의 인적 구성은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다. 높은 여성 비율과 낮은 근속이 유지되고 있었고, 평균 연령, 교육수준,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직종, 수도권 근로비율에서 다른 부문과 차이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고연령, 저학력, 짧은 근로시간, 비정규직, 서비스직 중심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타 부문은 이러한 기존의 인적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다르게, 복지서비스 부문은 저임금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자리가 확대되어 왔다.
둘째, 평균임금으로 볼 때 시간당 임금 격차는 완화되었지만, 월 임금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시간당 임금 격차의 완화는 실질적 임금 보상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월 수입 격차는 확대되어, 실질적 생활보장과 직업적 전망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임금을 100%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67.7%, 월 임금은 59.3%(2023년 기준) 수준이다. 그리고 격차에서 특성 차이로 설명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13.1%, 월 임금은 10.4%를 적게 받는 임금불이익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대적 열위의 일자리 특성은 종사자의 사기와 근로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하위임금 종사자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하위 10분위에서, 월 임금의 경우 하위 10분위부터 30분위까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본 수준이 낮고 적절한 보상체계 밖의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월임금의 경우 고임금층보다 저임금층에서 격차가 더 심한데, 이는 이들 일자리가 근로시간이 짧은 구조적 요인도 격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동일 부문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하위임금층 종사자에게 미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OB 분해를 통해 격차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하위임금에서는 구성효과(변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 상위임금에서는 구조효과(변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가 격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적 구성은 하위임금에서 차이가 크고 상위임금에서는 유사해지기 때문에 특히 고임금층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산업의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세적 측면에서,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 구성효과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월 임금 격차에서는 반대로 구성효과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시간당 임금에서 구성효과의 감소는 특성 차이가 줄었다기보다는 계수 영향력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인적 구성(저학력, 고연령, 비정규직 등)은 임금에 불리하도록 변화해 왔지만, 각 특성에 대한 임금의 보상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격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저임금 경향은 몇 가지에 기인한다. 산업에 내재된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임금 개선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핵심 부문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강화되고 있었고, 부문 간 일자리의 위계를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는 감소하고 있었고, 그 수준과 구조는 임금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임금체계, 보상구조에 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부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 또한 크다. 정부는 서비스 수가나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종사자의 실질적인 수입과 직결된다.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공급에 있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물론 적절한 수준의 재정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따른 공급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일 것이다. 서비스로 인해 개선되는 삶의 질과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정이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민간 위탁, 낮은 수가 책정의 구조 속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확대 또는 공급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경쟁력 향상과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독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제공인력 육성에 관한 논의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적 성장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핵심 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견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경향이 강하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임금 격차에서 구조효과보다 구성효과의 크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더 주목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급자가 난립할 수 있도록 약한 규제를 적용해 왔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산업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서비스 질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격제도의 강화, 돌봄노동자의 경력에 대한 보상수준 차등화 등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수한 제공인력을 육성해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단계적 임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수준과 타 부문과의 격차의 변화, 격차의 구조적 요인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의사결정과 학술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임금 격차의 현실을 진단하거나 관련 제도적 성과들을 검토할 때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후속연구에서 더 정교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활용자료에는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와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세부 구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OB 분해방식은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관찰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포함될 경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구조효과가 줄어든다. 경력, 공공부문 여부, 노조유무 등의 변수들이 추가된다면 임금 격차의 구조와 변화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특성상 초과근로, 주휴수당 등 임금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임금 격차와 구조의 변화 추이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변화가 특정 제도나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특정 정책의 도입 전후의 임금 격차를 분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도 있지만,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우 괄목할만한 제도의 영향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점진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주목하기보다 변화의 추이만을 파악하였다. 만일 임금 개선의 효과를 특정 제도 시행에 주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면 준실험설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보다 엄밀한 평가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격차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정된 지면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특정 변수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로 넘긴다.
Notes
김승보 외(2023)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직업 위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2023년 조사에서 살펴본 15개 직업 중 사회복지사는 12위의 하위권으로 나타났다(13위는 공장근로자, 14위는 음식점종업원, 15위는 건설일용근로자).
통상 임금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시간당 임금과 월 임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김현경, 2024).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 자료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는지에 대한 응답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응답한 표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두 응답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RIF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υ(FY)는 종속변수 Y의 누적분포이다. IF는 특정 관측치가 분포 통계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분석기법이다. IF는 로 정의되는데, 어떤 통계량(가령 평균, 분위수, Gini 계수 등) υ(FY)에 대해 특정 관측치 yi가 추가되었을 경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통계량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변화량의 개념이다(Rios-Avila, 2020).
References
, . (2016).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임금 격차 추이와 원인 분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1], 62-10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72785
, , , , , . (2023).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2023) (기본연구 2023-1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2&pstNo=E120240098
, , . (20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고용 여건 개선방안 연구: 여성 다수 직종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1&idx=129946
, , , , , , . (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5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47141
, , , ,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개선 연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격 기준과 신규 직업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22-8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761229
, , , , , , . (2019).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9-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38685
, , , , . (2011).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https://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2379
, , , . (2020).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통계 구축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20-0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000208
, , , , , . (2013).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3-05).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75910
. (2023. 12. 12).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 KRIVET ISSUE BRIEF [271], 1-4. https://www.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08434
, , , , , , , . (2019).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연구보고서 201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egentouch-asset/10110/contents/5149896
, , , , , . (2022). 2022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공급조사 (정책보고서 2022-1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335
, .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정책보고서 2021-9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library/10110/contents/5173893
. (2010).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사회서비스연구, 1, 9-32.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807
, , , . (2011).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I):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정책연구 2011-14-01). 한국노동연구원. https://dl.kli.re.kr/egentouch-asset/10110/contents/6012522
. (2021).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61], 1-39.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28306
. (202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yonsei. https://dcollection.yonsei.ac.kr/public_resource/pdf/000000550717_20250427155722.pdf
, . (2023).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분석. 조사통계월보, 77(1), 3-16.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10075401&menuNo=200438
, , , , , , , , , , , . (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2023-10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egentouch-asset/10110/contents/6888647
. (2020. 11.). 돌봄노동의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는가?. 월간 노동리뷰 [188], 7-22. https://dl.kli.re.kr/library/10110/contents/6046191?checkinId=2351947&articleId=1481913
. (2007. 7.). 200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향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105], 21-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37843
. (2013).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서울경제, 104(11), 10-20.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31984
, , , . (2021).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21-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200000&bid=0001&list_no=10196&act=view
통계청. (2013-2023).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세트]. 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2025. 4. 24.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통계청. (2013-2023). 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세트]. 코시스(KOSIS). 2025. 4. 24. 검색,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10. 13.).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https://kefplaza.com/web/pages/gc7958 2b.do?siteFlag=www&mnuId=&returnUrl=&bbsAuth=0&bbsFlag=View&nttId=18583&bbsId=0001&bbsIds=002 4%2C0018&pageIndex=1&pageUnit=7
, . (2017).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산업노동연구, 23(3), 131-175.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58731
, , , , , , , , , & . (2012).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2-08). 한국노동연구원. https://dl.kli.re.kr/egentouch-asset/10110/contents/6012571
, , , . (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3-11). 한국노동연구원. https://dl.kli.re.kr/egentouch-asset/10110/contents/6014796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415-426. http://www.jstor.org/stable/181211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8).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https://www.ilo.org/publications/major-publications/care-work-and-care-jobs-future-decent-work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29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6-2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6-30

- 315Download
- 184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