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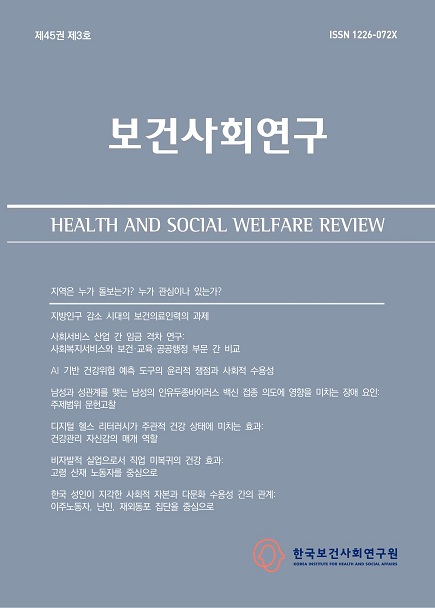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지방인구 감소 시대의 보건의료인력의 과제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 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Ⅰ. 지역 인구와 보건의료 필요 인구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2020년 51,836천 명에서 2030년 51,305천 명, 2050년 47,106천 명, 2070년 37,181천 명으로 향후 50년에 걸쳐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25).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이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는 지역보건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결정적 환경요인이다(김창엽, 2025).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9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김동진 외, 2024). 한이철 외(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612개 면 지역 중 의원이 없는 곳이 65.5%, 약국이 없는 곳이 59.2%에 달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인구수가 3천 명 이하로 떨어지면, 각종 의원이나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이 폐업하여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 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원 배분 방식에 의존하게 되면, 적정한 보건의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이 들어서기 어렵고, 보건의료기관이 없으므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역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별 민간의료자원은 이러한 인구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인구수의 변동에 근거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은 단순한 인구수의 증감이 아닌 보건의료의 필요에 기반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필요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구조, 특히 성과 연령이다. 실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역인구의 추계와 성별‧연령별 보건의료 필요도를 고려한 지역인구 추계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표 1).
표 1
시도별 일반 추계인구와 성별‧연령별 가중 추계인구의 추이 변화
(단위: 천 명)
| 일반 추계인구1) | 성별‧연령별 가중 추계인구2) | |||||||||
|---|---|---|---|---|---|---|---|---|---|---|
| ‘20년 | ‘30년 | ‘50년 | 증감비 (A) | 증감비 (B) | ‘20년 | ‘30년 | ‘50년 | 증감비 (A) | 증감비 (B) | |
| 전국 | 51,836 | 51,306 | 47,107 | 0.99 | 0.91 | 135,609 | 149,174 | 167,375 | 1.10 | 1.23 |
| 서울 | 9,618 | 9,096 | 8,090 | 0.95 | 0.84 | 24,616 | 26,123 | 27,839 | 1.06 | 1.13 |
| 부산 | 3,356 | 3,112 | 2,522 | 0.93 | 0.75 | 9,036 | 9,575 | 9,283 | 1.06 | 1.03 |
| 대구 | 2,414 | 2,243 | 1,846 | 0.93 | 0.76 | 6,283 | 6,667 | 6,710 | 1.06 | 1.07 |
| 인천 | 2,951 | 3,098 | 3,006 | 1.05 | 1.02 | 7,375 | 8,776 | 10,508 | 1.19 | 1.42 |
| 광주 | 1,480 | 1,403 | 1,207 | 0.95 | 0.82 | 3,689 | 3,957 | 4,190 | 1.07 | 1.14 |
| 대전 | 1,492 | 1,427 | 1,274 | 0.96 | 0.85 | 3,716 | 4,021 | 4,375 | 1.08 | 1.18 |
| 울산 | 1,139 | 1,053 | 853 | 0.92 | 0.75 | 2,781 | 3,006 | 3,100 | 1.08 | 1.11 |
| 세종 | 348 | 436 | 532 | 1.25 | 1.53 | 798 | 1,095 | 1,644 | 1.37 | 2.06 |
| 경기 | 13,452 | 14,284 | 14,007 | 1.06 | 1.04 | 33,132 | 39,665 | 47,939 | 1.20 | 1.45 |
| 강원 | 1,519 | 1,517 | 1,459 | 1.00 | 0.96 | 4,184 | 4,736 | 5,539 | 1.13 | 1.32 |
| 충북 | 1,631 | 1,638 | 1,565 | 1.00 | 0.96 | 4,270 | 4,832 | 5,670 | 1.13 | 1.33 |
| 충남 | 2,177 | 2,254 | 2,211 | 1.04 | 1.02 | 5,742 | 6,635 | 8,032 | 1.16 | 1.40 |
| 전북 | 1,806 | 1,694 | 1,480 | 0.94 | 0.82 | 4,977 | 5,277 | 5,607 | 1.06 | 1.13 |
| 전남 | 1,793 | 1,707 | 1,524 | 0.95 | 0.85 | 5,116 | 5,428 | 5,904 | 1.06 | 1.15 |
| 경북 | 2,652 | 2,524 | 2,215 | 0.95 | 0.84 | 7,354 | 7,949 | 8,580 | 1.08 | 1.17 |
| 경남 | 3,340 | 3,141 | 2,664 | 0.94 | 0.80 | 8,725 | 9,486 | 10,136 | 1.09 | 1.16 |
| 제주 | 669 | 680 | 652 | 1.02 | 0.97 | 1,708 | 1,947 | 2,318 | 1.14 | 1.36 |
출처:
-
1) “시도(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5
-
2) “시도(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5; “General Medical Services Statement of Financial Entitlements Direction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3.
통계청(2025)의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세종(1.53), 경기(1.04), 인천 (1.02), 충남(1.02)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부산(0.75), 울산(0.75), 대구(0.76)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연령별 보건의료 필요를 고려한 가중인구는 2050년이 되어서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서 성별‧연령별 가중인구는 영국 일차의료기관(GP Surgery)의 보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등록인구 수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성별, 연령별 가중값이다. 영국은 단순한 등록인구수가 아니라 성별‧연령별 가중치에 따른 인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5~14세의 남성을 1로 하여, 성별‧연령별로 차등 가중값을 적용하는데 85세 이상 여성이 6.72로 가장 높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3). 그 외, 장애인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영국의 성별‧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부산(1.03)에서 세종(2.06)로 2050년까지 보건의료의 필요도를 고려한 인구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특‧광역시보다 보건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에서의 단순 인구수에 비해 보건의료 필요도를 고려한 가중인구의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은 보건의료인력 개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단위인구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건의료인력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수와 간호사수 모두 부족한 유형에 속한다. 2000년과 2022년의 기간의 변화를 보면,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한의사 포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인구 천 명당 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근접하였다(그림 1).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의사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OECD 회원국들의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수 변화
출처: “Healthcare human resources”, OECD Health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 이용 저자 작성.
OECD 회원국의 평균을 기준(2022년)으로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수(의사와 한의사)와 활동 간호사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제시하였다(그림 2). 이는 OECD 보건통계에서 산출하는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수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시도별로는 서울만 유일하게 활동 의사수와 활동 간호사수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북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활동 의사수는 모두 낮았다. 그 외 광역도 지역들은 활동 의사수와 활동 간호사수 모두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도별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수 분포(2022년 기준)
주: 기준선은 2022년도 OECD 회원국 평균임.
출처: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의사,약사 등)”, 통계청, 2023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사 인력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인구 천 명당 전체 의사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2.68명), 대구(2.66명), 대전(2.63명), 부산(2.57명) 등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반면 광역도에서는 낮은데 특히 세종(1.36명)과 경북(1.41명)이 낮다. 인구 천 명당 병원 근무 의사수는 역시 서울이 1.94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1.47명), 대전(1.38명), 대구(1.37명), 부산(1.32명)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세종(0.45명), 경북(0.59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과 유형별 의사수(2023년 기준)
| 시도 | 치료가능사망률1) (인구 10만 명당) |
전체 의사수2) (인구 1천 명당) |
병원근무 의사수3) (인구 1천 명당) |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4) (인구 1천 명당) |
|---|---|---|---|---|
| 서울 | 39.55 | 3.61 | 1.94 | 1.25 |
| 부산 | 49.47 | 2.57 | 1.32 | 1.08 |
| 대구 | 45.86 | 2.66 | 1.37 | 1.10 |
| 인천 | 49.59 | 1.89 | 0.93 | 0.82 |
| 광주 | 45.54 | 2.68 | 1.47 | 1.17 |
| 대전 | 41.81 | 2.63 | 1.38 | 1.02 |
| 울산 | 36.93 | 1.67 | 0.84 | 0.73 |
| 세종 | 40.98 | 1.36 | 0.45 | 0.68 |
| 경기 | 42.32 | 1.80 | 0.84 | 0.77 |
| 강원 | 49.26 | 1.82 | 1.05 | 0.76 |
| 충북 | 49.94 | 1.58 | 0.71 | 0.66 |
| 충남 | 46.39 | 1.54 | 0.69 | 0.64 |
| 전북 | 48.14 | 2.11 | 0.97 | 0.87 |
| 전남 | 47.57 | 1.74 | 0.83 | 0.72 |
| 경북 | 47.91 | 1.41 | 0.59 | 0.64 |
| 경남 | 44.27 | 1.75 | 0.91 | 0.77 |
| 제주 | 45.67 | 1.82 | 0.80 | 0.77 |
| 치료가능사망률과의 상관계수 | -0.2095 | -0.1802 | -0.1702 |
출처:
-
1) “치료가능사망률(OECD 기준)”, 헬스맵, 2025a, https://www.healthmap.or.kr/
-
2) “인구당 의사수(전체의료기관)”, 핼스맵, 2025b, https://www.healthmap.or.kr/
-
3) “인구당 의사수(병원급 이상)”, 헬스맵, 2025c, https://www.healthmap.or.kr/
-
4) “시군구별‧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현황”, 통계청, 2023a;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 통계청, 2023b.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신현웅 외, 2025) 수의 분포를 보면, 서울이 역시 인구 천 명당 1.25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1.17명), 대구(1.10명), 부산(1.08명), 대전(1.02명)으로 주요 대도시들은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이었으나, 그 외 시도는 모두 1명 미만이었고, 경북이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받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치료가능사망률(2023년)은 울산(36.93명), 서울(39.55명), 세종(40.98명)은 낮았고, 충북(49.94명), 인천(49.59명), 부산(49.47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치료가능사망률과 의사인력 유형별 분포와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었다. 의사인력 유형별로 보면, 치료 가능사망률이 가장 낮은 울산은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1.67명), 병원 근무 의사수(0.84명), 필수의료분야 전문의수(0.73명)는 낮은 편에 속하였다. 반면, 부산은 단위인구당 의사수가 많음에도, 치료가능사망률은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즉, 서울을 제외하고는 치료가능사망률과 의사인력 간에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는 의료이용 양상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방 암환자의 약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희승의원실, 2024).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암환자가 서울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료 분위 간 격차는 2008년 10.8%에서 2023년 7.7%로 줄어들었다. 지난 15년에 걸쳐 서울로 암수술을 받으러 가는 지방 암환자의 수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경제적 장벽도 많이 완화되어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도 상당 수준 줄어들었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지방 암환자의 서울로의 이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III . 지역 보건의료인력 정책
1. 그간의 주요 정책
지역보건의료인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면상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그간의 주요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좌초되거나(지역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제한적(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시니어의사제 등)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인력 공급의 중심은 군 의무복무를 대신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에만 배치될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 원 등 취약지역 공공병원과 심지어 민간병원에도 배치되어 지역의사 공백의 문제에 대처해 왔다. 하지만, 현역병 근무기간의 단축과 지원 인력의 구조적 감소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근간이 위협받은 지 오래다. 심지어, 3년 단기 인력으로 지역의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정책 방안은 아직까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외 지역의료인력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보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공중보건장학제도(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22),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2025a), 지역 필수의사제(보건복지부, 2025b) 등이 그것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것으로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최근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 선발 인원은 계속 미달 상태이며, 간호사의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2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역의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봉책에 그친다. 여기에다가 “의사사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를 4개 광역지자체에서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아직 제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충원율이 낮으며, 대부분 대학병원 중심으로 충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정책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편,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간호대학의 정원 확대로 수적 부족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급격한 인력 증대로 인한 교육의 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도서벽오지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건진료원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895개1)의 보건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5c), 향후 통합돌봄의 시대에서 이들 인력이 농어촌 지역보건의료인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 과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신영석 외,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양적으로 부족하며(특히 일차진료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며 세부전문 분야 중심이고, 지리적‧의료기관유형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지역의료체계 구축,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 등을 통한 의사인력의 확충과 분포를 개선하고, ② 전문과목별 추계에 기반한 과목별 정원 조정, 일반의학과 지역사회 중심 수련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재정지원 등을 통한 일차진료의사와 전문의 양성을 합리화하며, ③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을 통한 의사인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양성의 급격한 확대, 간호실습교육의 질적 저하, 지역별 간호사 분포의 불균형,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갈등과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불균형 등을 지적하였다. 그 해결 과제로는 ① 체계적 간호사 추적 관리시스템,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이직률 감소 등을 통한 간호사의 적정 수급 관리, ② 간호대학 실습 내실화,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양질의 간호사 양성, ③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 기준 정비,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④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양성 및 배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성공적인 보건의료인력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수와 적절한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roezen et al., 2018). 여기에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 요소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치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지역 보건의료인력은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 효율성(생산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인력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학부과정에서는 지역의 보건의료 필요에 기반하여 적정 입학 정원을 배정하고,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원제 등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총량을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이탈을 막으며, 포괄적 건강증진과 통합돌봄의 시대에 맞는 준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력 분포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자유시장적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지역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제적이며, 규제적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는 국가 필수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농어촌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며,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실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졸업 이후에는 공동수련과정을 통한 지역의료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공공형 일차의료센터 확충,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며, 특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적 공급과 분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도 인력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력의 질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 교육의 내용에 의료 중심에서 공중보건의 내용을 강화하며, 교육기관 인증제도와 보건의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교육 연수기관을 지정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서는 지역 보건의료적 관점에서의 보수교육과 지역 의료 및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표준역량 개발과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3. 주민참여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범위의 확장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률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인의 활동으로 국한되며, 그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을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강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주민 참여 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돌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비전문가적 활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의 사회적 처방을 수행하는 링크 워커(Link Worker), 비전문가적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건강조언자(Lay Health Advisor) 활동 등이다. 특히,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비전문가적 건강 지지 활동이 매우 중요해진다. 과거 일차보건의료사업에서의 마을건강요원과 같이 건강증진과 신공중보건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경남, 경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건강지도자, 마을건강활동가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활동(윤태호, 2024)을 보건의료인력의 활동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IV. 보건의료 지방분권화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상활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단일수가 방식으로 지역의 취약성이나 인구구조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농촌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관계없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수가의 지불 역시 개별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지역의료라는 개념이 국민건강보험에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이 수십 년간 고착화할 결과, 의료수요가 많은 곳, 즉 인구가 많은 곳에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지역의 자원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인근의 비포화지역으로 확대해가는 전적으로 시장성에 기반한 자원 불포에 기반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재원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개별 의료기관의 청구에 기반하여 작동하므로 지역보건의료의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실제, 시도‧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의료이용통계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국민건강보험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정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료이용의 자체충족률을 높이려는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은 전무한 상황에서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다. 결국,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한 지역보건의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능만 작동하고, 대부분의 의료자원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건강보험의 수가 청구에 의존해서 개별 의료기관이 보다 더 잘 생존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과 ‘보건의료’는 있지만, ‘지역보건의료’는 사실상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역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외에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실제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분권화는 관리적 기능과 재정적 기능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며, 지역에 기반한 영국의 통합케어체계(Integrated Care System)가 대표적인 예이다(Charles, 2022).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지역 간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적절한 계획수립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체를 구축한다(그림 4). 시도단위별로는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 권역 단위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중진료권 단위별로는 중진료권에 소재하는 시군구 대표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 단위 주요 병원 등 자원들로 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한다.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별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건강 관련 자원들과의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들 협의기구에는 계획의 수립과 자원의 배분, 보건의료 서비스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 단위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통합돌봄의 시대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지역의 수준에 따라 지역 기반 파트너십과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영국의 지방분권형 통합돌봄체계(House of Commons, 2023)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과 환경을 같이 공유하고 영향을 받는 소생활권이나 읍면동과 같은 지역공동체 수준에서의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미래의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들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합체인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소생활권별로 거점센터(예컨대, 생활권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운용하고, 읍면동 별로는 주민건강팀을 운영하여 일차의료네트워크와 지역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보건소 기능개편과 연계하여 인력 배치의 조정 및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보건의료자원이 극도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공적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기능인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용할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정백근, 2025).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시설과 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을 직접 투자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극히 꺼리기 때문이다.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단기 인력인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은 없거나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읍면지역의 절대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필요도를 반영한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일차의료와 공중보건 기능을 수행할 “공공형 일차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일차의료기관”은 보건지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3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상주하도록 하여 재택의료 등 통합돔봄서비스 제공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시설은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되 운영은 민간 의료인이 하는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수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기금 등을 통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먼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그 실효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는 이러한 지역보건의료체계와 계획에 기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마치며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의 필요를 고려한 지역의 인구는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보건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요구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한 노후,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볼 때 전문적 보건의료인력 양성뿐 아니라 역량있는 주민들을 통한 비전문적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렵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요하며,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책 우선순위는 언제나 병원 치료서비스 중심이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그 결과 병상은 공급과잉 상태이고, 일차의료와 지역보건은 취약한 보건의료체계가 공고화되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NHS 장기계획의 핵심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로 요약할 수 있다(UK Government, 2025).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역시 이러한 장기계획의 기조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기조는 아일랜드, 덴마크 등 여러 국가들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Reed et al., 2025). 이에 비해 우리는 다른 OECD 회원 국가들의 2배나 더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병원 중심의 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자원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미래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지역사회”와 “예방”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나,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수는 최소한 2050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복합적인 보건의료 필요가 있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지역 보건의료인력계획 역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는 지방분권화에 기반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References
. (2023a). 시군구별‧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 (2023b).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 (2023c).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의사,약사 등).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 (2025). 시도(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 (2025a). 치료가능사망률. https://www.healthmap.or.kr/indicator
. (2025b). 인구당의사수(전체의료기관). https://www.healthmap.or.kr/indicator
. (2025c). 인구당의사수(병원급 이상). https://www.healthmap.or.kr/indicator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3). General Medical Services Statement of Financial Entitlements Directions..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eral-medical-services-statement-of-financial-entitlements-directions
House of Commons. (2023). The structure of the NHS in England.. Available at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7206
, , & (2018). The joint action on health workforce planning and forecasting: results of a European programme to improve health workforce policies. Health Policy, 122, 87-93. [PubMed]
OECD Health Statistics. (2025). Healthcare human resources. https://data-explorer.oecd.org/?fs[0]=Topic%2C1%7CHealth%2 3HEA%23%7CHealthcare%20human%20resources%23HEA_RES%23&pg=0&fc=Topic&bp=true&snb=16
UK Government. (2025). Fit for the future. 10 year health planc for england. Available at www.gov.uk/official-documents

- 1086Download
- 326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