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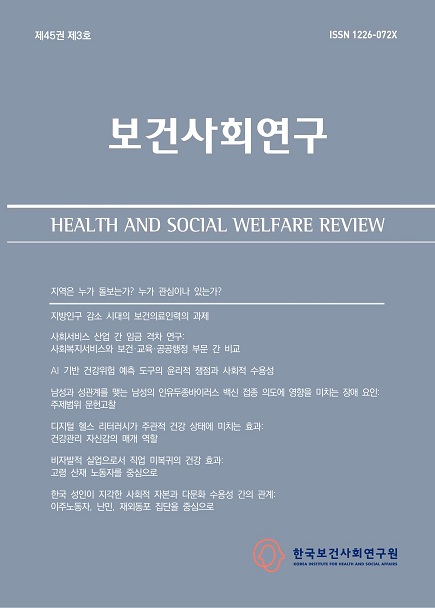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 고령 산재 노동자를 중심으로
The Health Recovery Effects of Non-Return to Work as a Form of Involuntary Unemployment: Focusing on Older Industrial Accident Workers
Choi, Seoyoung1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104-125,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104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분석 결과,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60대 이상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더 뚜렷했고, 이들은 재해 당시보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에도 미복귀보다 복귀가 건강 회복에 긍정적이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이러한 결과는 업무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퇴장이 고령층의 건강에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박탈이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낳지 않도록 생계와 사회관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turn to work on the health recovery of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While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on the return-to-work outcomes of injured worker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verse relationship—that is, how return-to-work outcomes affect health recovery. However,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not only a means of livelihood but also an opportunity to access a variety of social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failure to return to work can serve as a trigger for resource depriv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non-return to work influences health outcomes among older injured workers, a group that is both more vulnerable in terms of health and faces greater barriers to reemployment. To this end,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s(DDD) designs with propensity score-based weight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eturn to work on health recovery is more pronounced among workers aged 60 and above. Moreover, even when these workers returned to jobs with less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compared to their pre-injury positions, return to work still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covery than non-retur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dden labor market exit due to work-related health problems is particularly detrimental to the health of older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for older injured workers, and when return is not feasible, to provide programs that help maintain livelihood, social relationships, and physical activity so as to prevent th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of labor market exi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건강 상태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지만, 반대로 직업 복귀 성과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는 생계 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직업 복귀 실패는 다양한 자원 박탈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를 적용한 이중·삼중 차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60대 이상 고령 산재 노동자 집단에서 더 뚜렷했고, 이들은 재해 당시보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에도 미복귀보다 복귀가 건강 회복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퇴장이 고령층의 건강에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직업 미복귀가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낳지 않도록 생계와 사회관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이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직업 복귀 성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해 온 기존 연구들은 장해등급, 요양 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관련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왔다(박은주, 2014; 안준기, 오세미, 2015; 한기명, 이민아, 2017). 그러나 고용 상태 혹은 고용 상태 변화의 건강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 누적되어 있음에도(변금선, 이혜원, 2018; 최요한, 2014; 홍정림, 2022; 박주영 외, 2016), 직업 복귀 성과가 다시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 건강 회복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차별·배제와 건강 사이의 악순환을 드러낼 것이다.
본 연구의 전제는 직업 미복귀가 시간 흐름에 따른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방해함으로써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재 노동자의 건강은 요양 종결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직업 복귀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고령 산재 노동자는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은퇴 연령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미복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못 해온 면이 있다. 하지만 고령 산재 노동자의 직업 미복귀는 산재 다발 업종 종사자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노후 대비 미흡을 고려할 때 비자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은 기본적인 건강 취약성이 높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이 고령층 건강을 악화시키고(김범수, 최은영, 2017),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안서연, 이현주, 2015; 허성호 외, 2011; 정윤경, 2016)는 이미 존재한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건강한 노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 일차적이겠으나, 취업은 그 자체로 노인의 규칙적인 생활, 사회관계, 신체 활동 촉진 등을 통해 신체적인 허약을 지연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허성호 외, 2011).
경험 분석을 위해 산재보험패조사 2차 코호트 1차(2017)와 3차(2019) 자료에 대한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 삼중 차분 분석(DID & DDD)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향점수 기반 매칭을 수행한 후,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직업 미복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을 적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건강 회복에 직업 미복귀가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삼중 차분을 적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선 비자발적 실업의 건강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와 건강 회복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세운다. 다음으로 Ⅲ장에선 본 연구에 활용된 경험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Ⅳ장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Ⅴ장에선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논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직업 미복귀와 건강
산재 이후 노동시장 경험을 다룬 기존 연구는 요양 및 건강 특성이 직업 복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왔다(배화숙, 2017; 안준기, 오세미, 2015; 박은주, 2014; 2018; 양재성 외, 2012; 한기명, 이민아, 2017).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산재 노동자일수록,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한다. 이처럼 건강이 직업 복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됐지만, 직업 복귀 성과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고용 상태와 건강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비자발적 실업의 부적 건강 효과를 지적해 왔음을 고려할 때(최요한, 2014; 홍정림, 2022; 허종호 외, 2010; Browning & Heinesen, 2012; Kuhn et al., 2009),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직업 미복귀 역시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들의 비자발적 실업이 산재라는 특수한 건강 문제를 경유해 발생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경우 산재 노동자는 신체 부담이 높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비자발적 실업의 건강 효과라는 주제를 ‘건강한 몸’이 소득의 주된 원천이었던 사람들이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겪은 후 곧 바로 노동시장 배제를 경험할 때 그 배제의 건강 효과가 어떠한지로 확장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직업 미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방해하는 주된 경로는 직업 수입의 박탈이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건강 의료 영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첩 박탈로 이어져(허종호 외, 2010)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세린 외, 2020; 문석준 외, 2022; 김보름 외, 2020; 이은혜, 2022). 비근로 상태는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 곤란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며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건강 영향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Deb et al., 2011; Marcus, 2014).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직업 미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체 부담이 높은 직업 이력과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직업 복귀 자체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비자발적 실업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터로 복귀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재 노동자의 직업 미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와 그 정도를 검증함으로써 고령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고령 산재 노동자의 비자발적 은퇴와 건강
본 연구는 직업 복귀 성과가 산재 노동자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도 주목한다. 본 연구가 이와 관련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고령층에서 크게 나타나는가다. 고령 산재 노동자는 직업 복귀율이 저조한 집단인데(양재성 외, 2012; 박은주, 2014), 이는 직업 복귀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연령대로 요양 종결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고령 산재 노동자의 직업 미복귀가 자발적 퇴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직업 복귀를 희망하는데 건강과 연령상의 이유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비자발적 성격을 갖고 있고, 요양 종결 이후 스스로 퇴직을 선택한다고 해도 재해 이전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고령자가 산재를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 퇴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은퇴와 고령자 건강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는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김범수, 최은영, 2017; 박창제, 2013; 석상훈, 2011; 이승렬, 2007), 고령 산재 노동자의 직업 미복귀가 건강 회복에 부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2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고령 산재 노동자는 기본적인 건강 취약성이 높아, 다른 연령대의 산재 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시장 배제로 인한 박탈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부적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로 상태로 인한 신체 활동 감소와 사회적 고립은 허약(혹은 노쇠, frailty)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김정욱, 최영, 2023). 허약은 개념적 정의나 측정 방식 이 완전히 합의되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일상생활 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상당한 감소로 인한 타인 의존 필요성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의되어 왔다(김창오·, 김문종, 2011). 노인의학에선 허약보다 노쇠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노화와 노쇠를 구분해 노쇠의 예방하는 것을 노인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본다(이은환 외, 2022). 노쇠는 노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기 보단, 운동 부족이나 영양섭취 부족, 질병 및 약물 복용,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Fried et al., 2001). 노인 일자리의 낮은 질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더 건강한 이유도 건강한 노인이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안서연, 이현주, 2015; 허성호 외, 2011; 정윤경, 2016).
Ⅲ. 경험 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2차 코호트 자료 중 1차(2018)와 3차(2020)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요양 종결 산재 노동자를 5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산재 노동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상병 및 요양 특성, 재해 당시 일자리와 복귀 일자리 특성,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차 조사 당시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한 요양 종결 산재 노동자 1,234명 중 장해 연금을 수급하는 장해 1~7급 산재 노동자 244명을 제외한 990명이다.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금 수급 자체가 노동시장 참여 동기를 낮출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중· 삼중 차분 방법을 활용해 직업 (미)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때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선 직업 복귀 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직업 복귀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다른 집단(본 연구의 맥락에선 중증 장해 산재 노동자와 경증 혹은 무장해 산재 노동자) 간의 비교는 권장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차와 3차 조사 동안 연속해서 (미)복귀 상태를 유지한 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1) 이외 일부 통제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결과, 실제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차 기준 662명이었다(표 1을 참고). 분석 대상은 실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분류한다. 실험군은 1차 조사 당시 직업 미복귀 상태였다가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연속으로 직업 복귀 상태를 유지한 집단이다. 반대로 대조군은 1차 조사에 이해 2-3차 조사에서도 직업 미복귀 상태를 유지한 산재 노동자 집단이다.
표 1
직업 복귀 여부에 따른 시점별 표본 수
| 시점 | 직업 미복귀 (treated=0) | 복귀 (treated=1) | 합계 |
|---|---|---|---|
| t=0 | 379 | 283 | 662 |
| t=1 | 356 | 284 | 640 |
| 735 | 567 | 1302 |
2. 분석 변수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를 묻는 문항과 인지·실내·실외·직업 활동 각각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 총 5개 문항(표 2)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해 구성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을 선형 결합하여 공통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통계적 기법이다. 본 연구는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1개의 주성분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주성분은 전체 분산의 73.1%를 설명하였다(표 3). 각 문항의 주성분 적재값은 0.775~0.931 사이로 모두 0.7이상 이었다(표4). 구성된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0.90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3
일상생활 수행능력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요약
| 주성분 적재 값 | 고유 분산 | |
|---|---|---|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0.775 | 0.399 |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웃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 활동 | 0.910 | 0.171 |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쇼핑하기 등 집밖 활동동 | 0.931 | 0.133 |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직업 활동 | 0.815 | 0.336 |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역코딩) | 0.834 | 0.304 |
표 4
일상생활 수행 관련 문항의 주성분 적재값 (Factor Loadings)
| 고유값(Eigenvalue) | 차이 | 분산 비율 | 누적 분산 비율 | |
|---|---|---|---|---|
| 일상생활 수행의 | ||||
| 어려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3.656 | 3.124 | 0.731 | 0.731 |
|
|
||||
| 일상생활 수행의 | ||||
| 어려움: 웃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 활동 | 0.532 | 0.142 | 0.106 | 0.838 |
|
|
||||
| 일상생활 수행의 | ||||
| 어려움: 쇼핑하기 등 집밖 활동 | 0.389 | 0.096 | 0.078 | 0.915 |
|
|
||||
| 일상생활 수행의 | 0.293 | 0.164 | 0.059 | 0.974 |
| 어려움: 직업 활동 | ||||
|
|
||||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역코딩) | 0.130 | 0.026 | 1.000 | |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주관적 건강을 묻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5개 문항 이외에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 상태” 문항이 존재한다. 다만 이 문항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문항들과 상관관계가 약해 합성 변수에 포함시키기 적절하지 않았다(상관계수 0.394~0.584, 표 5 참고).
표 5
산재 노동자 주관적 건강 관련 문항 상관행렬
| 문항 | (1) | (2) | (3) | (4) | (5) | (6) |
|---|---|---|---|---|---|---|
| (1) 현재 전반적인 건강 상태 | 1.000 | |||||
| (2)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0.394 | 1.000 | ||||
| 3)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웃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 활동 | 0.476 | 0.673 | 1.000 | |||
| (4)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쇼핑하기 등 집밖 활동 | 0.536 | 0.648 | 0.858 | 1.000 | ||
| (5)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직업 활동 | 0.584 | 0.513 | 0.630 | 0.720 | 1.000 | |
| (6)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역코딩) | 0.548 | 0.510 | 0.700 | 0.723 | 0.626 | 1.000 |
2) 처치변수
본 연구의 처치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산재 요양종결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이하 ‘직업 복귀 성과’)가 있다. 여기서 실험군은 1차 조사 당시 미복귀 상태였다가 2-3차 조사에서 연속으로 복귀 상태를 유지한 직업 복귀 집단이고, 대조군은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연속으로 미복귀 상태를 유지한 직업 미복귀 집단이다. 둘째, 60대 이상 고령자 여부(이하 ‘연령’)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은 일종의 상호작용 변수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60대 미만과 60대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 재해 및 요양 관련 요인,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이 있다. 성별은 여성이 “1”로, 남성이 “0”으로 코딩된 더미변수이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이 “1”로, 배우자 없음이 “0”으로 코딩된 더미변수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을 기준으로 고졸, 대졸로 구분하였다.
재해 및 요양 관련 요인으로는 재해 유형, 요양 기간, 장해등급이 있다. 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0”이고 업무상 사고는 “1”로 코딩하였다. 요양 기간은 3개월 이하는 “1”,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2”,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는 “3”, 9개월 초과 1년 이하는 “4”, 1년 초과 2년 이하는 “5”, 2년 초과는 “6”으로 구성된다. 실험군인 직업 복귀 집단의 요양기간 평균은 2.577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사이로 나타났다. 대조군인 직업 미복귀 집단의 요양기간 평균은 2.98로 실험군과 비슷한 구간에 속했지만 다소 길게 나타났다. 장해 등급은 연속변수로 노동 능력 손실 정도가 가장 높은 1급(“1”)부터 무장해(“15”)까지 구성된다. 산재 노동자는 요양 종결 시점에 장해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무장해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장해 등급을 받을 경우 노동능력 손실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을 받게 된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장해 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7급 미만 요양 종결 산재 노동자이기 때문에 장해 등급 변수의 최소값은 “8”이고 최댓값은 무장해인 “15”이다. 실험군인 직업 복귀 집단의 장해등급 평균은 12.366이고, 대조군인 직업 미복귀 집단의 장해등급 평균은 11.8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으나 미복귀 집단의 노동 능력 손실 정도가 약간 더 컸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균등화 개인소득, 국민연금 가입,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가 있다. 균등화 개인 소득은 가구소득을 루트 가구원 수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에선 이 값을 로그 변환해서 사용했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할 때 가구원 수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본 연구에서처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제곱근 지수 방법이 선호되어 진다. 실험군인 직업 복귀 집단의 평균 균등화 개인 소득(로그)은 7.541이고, 대조군인 직업 미복귀 집단의 평균 균등화 개인 소득(로그)는 6.838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재해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1”, 미가입자였으면 “0”인 더미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금용 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는 자산 혹은 부채의 유무와 총액, 소속 구간 세 가지 형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활용해 측정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응답자에게 자산/부채 유무를 물은 뒤, “있음”으로 답할 경우 총액을 묻고 정확한 액수를 모르면 소속 구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셋 중 하나의 변수만 활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결측치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무와 총액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재코딩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금융 자산은 500만 원 미만은 “1”,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2”,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3”, 3천만 원이상 5천만 원 미만은 “4”,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5”, 1억 이상은 3억 미만은 “6”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자산은 500만 원 미만은 “1”,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2”,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4”,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5”, 1억 이상~3억 미만은 “6”, 3억 이상 5억 미만은 “7”, 5억 이상 10억 미만은 “8”, 10억 이상은 “9”로 구성된다. 부채는 500만 원 미만은 “1”,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2”,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미만은 “3”, 3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4”,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5”, 1억 이상 3억 미만은 “6”, 3억 이상 5억 미만은 “7”, 5억 이상 10억 미만은 “8”, 10억 이상은 “9”로 구성된다. 실험군인 직업 복귀 집단의 평균 금융 자산은 2.07, 부동산 자산은 4.053, 부채는 2.141정도였다. 대조군인 직업 미복귀 집단의 평균 금융 자산은 1.865, 부동산 자산은 4.098, 부채는 1.59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래 <표 6>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6
기초통계량
| 미복귀 | 복귀(전체) | |||||||
|---|---|---|---|---|---|---|---|---|
| mean | std | min | max | mean | std | min | max | |
| 일상생활 수행능력 | 0.003 | 0.907 | -2.363 | 1.232 | 0.577 | 0.65 | -1.754 | 1.232 |
| 성별 (여성=1) | 0.244 | 0.43 | 0 | 1 | 0.208 | 0.406 | 0 | 1 |
| 연령 (60대이상=1) | 0.716 | 0.451 | 0 | 1 | 0.387 | 0.488 | 0 | 1 |
|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1) | 0.657 | 0.475 | 0 | 1 | 0.602 | 0.49 | 0 | 1 |
| 고졸 미만 | 0.596 | 0.491 | 0 | 1 | 0.387 | 0.488 | 0 | 1 |
| 고졸 | 0.326 | 0.469 | 0 | 1 | 0.472 | 0.5 | 0 | 1 |
| 대졸 | 0.079 | 0.27 | 0 | 1 | 0.141 | 0.348 | 0 | 1 |
| 업무상 사고 | 0.921 | 0.27 | 0 | 1 | 0.968 | 0.175 | 0 | 1 |
| 업무상질병 | 0.079 | 0.27 | 0 | 1 | 0.032 | 0.175 | 0 | 1 |
| 요양 기간 | 2.98 | 1.391 | 1 | 6 | 2.577 | 1.249 | 1 | 6 |
| 장해등급 균등화 | 11.893 | 2.362 | 8 | 15 | 12.366 | 2.249 | 8 | 15 |
| 균등화 개인소득 (로그) | 6.838 | 0.966 | 1.733 | 8.987 | 7.541 | 0.683 | 4.441 | 9.055 |
| 국민연금 가입 | .441 | 0.497 | 0 | 1 | 0.521 | 0.5 | 0 | 1 |
| 금융자산 | 1.865 | 1.426 | 1 | 8 | 2.07 | 1.464 | 1 | 6 |
| 부동산 자산 | 4.098 | 2.411 | 1 | 9 | 4.053 | 2.445 | 1 | 8 |
| 부채 | 1.59 | 1.343 | 1 | 8 | 2.141 | 1.74 | 1 | 6 |
| 관찰 개수 | 356 | 284 | ||||||
3. 분석 방법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를 생성한다. 성향점수는 관찰된 공변량들이 주어졌을 때 개인이 특정한 처치를 받게 될 조건부 확률이다(Rosenbaum & Rubin, 1983), 분석을 위해 STATA17에서 매칭 명령어(psmatch2)를 실시해 성향 점수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생성하였다.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커널 매칭(kernel matching) 방식을 사용했다.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변량을 유사하게 조정해 선택편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중 커널 매칭을 활용해 성향점수 기반 가중치를 생성하면 표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처치변수인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1차 조사 당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토대로 매칭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칭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고용 형태, 직종, 업종, 기업규모, 근로기간), 재해 유형, 요양 기간, 장해 등급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수를 포함했다.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처치 이전 건강 상태가 유사한 집단 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칭을 실시한 후 매칭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공변량의 균형성을 확인해 매칭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매칭 전에는 B 값이 77.4%로 기준치인 25%를 초과하여 공변량 불균형이 컸지만 매칭 후에는 B 값이 13.2%로 감소하고 R값도 1.12로 허용 범위인 0.5~2 사이에 있어 공변량 균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세한 결과는 부도 1과 부표 1).2)
표 7
성향점수 매칭에 사용된 변수 목록
| 분류 | 변수명 | 설명 | 변수 특성 |
|---|---|---|---|
| 인구 사회학적요인 | 연령 | 1 "30대 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 순서형 |
| 배우자 유무 (기준: 배우자없음) | 1 “배우자 있음” | 더미 | |
| 교육 수준 (기준: 고졸미만) | 1 “고졸” | 더미 | |
| 1 “대졸 이상” | 더미 | ||
|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 | 고용형태 (기준: 상용직) | 1 “임시직” | 더미 |
| 1 “일용직” | 더미 | ||
| 1 “자영업자” | 더미 | ||
| 직종 (기준: 독립1차) | 1 “하위1차” | 더미 | |
| 1 “하위2차” | 더미 | ||
| 업종 (기준: 기타업종) | 1 “제조업” | 더미 | |
| 1 “건설업” | 더미 | ||
| 기업규모 (기준: 소기업 30인 미만) | 1 “중기업 30인 이상 300인 미만” | 더미 | |
| 1 “대기업 300인 이상” | 더미 | ||
| 근로기간 | 1“1개월 미만” ~ 14 “20년 이상” | 순서형 | |
| 재해 및 요양특성 | 재해 유형 (기준: 업무상 사고) | 1 “업무상 질병” | 더미 |
| 요양기간 | 1 “3개월 이하”~ 6 “2년 초과” | 순서형 | |
| 장해 등급 | 8 “8급” ~ 15 “무장해” | 순서형 | |
| 1차 조사 당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연속형 |
둘째, 성향 점수 기반 가중치를 적용한 이중·삼중 차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중 차분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처치변수의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는 준 실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t0= 직업 미복귀, t1= 직업 복귀 집단이고, 대조군은 t0= 직업 미복귀, t1= 직업 미복귀 집단으로 아래 식 (1)에 따라 분석했다. 여기서 Treatment Groupi는 1차 조사에서 미복귀 상태였으나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복귀한 경우 “1”을,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계속 미복귀 상태인 경우 “0”을 부여한다. Ti는 시점 변수로 1차 조사에서 관찰되면 “0”, 3차 조사에서 관찰되면 “1”의 값을 가진다. Treatment Group × Ti는 Treatment Groupi와 Ti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한다. 즉, B1은 직업복귀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분석에는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 (2)에 따라 삼중 차분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Age60i는 60대 이상이면 “1”, 60대 미만이면 “0”의 값을 가진다. Treatment ×T ×Age60는 삼중 상호작용항을 의미하며, 60대 이상 집단에서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보여준다.
Ⅳ. 경험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7급 미만 장해를 판정받았거나 무장해인 산재 노동자의 복귀 일자리 특성이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확인하였다. 두 그림은 복귀 일자리 특성을 각각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2개의 그래프로 구성되며 왼쪽은 60대 미만, 오른쪽은 60대 이상 복귀 일자리의 업종 분포를 보여준다.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미만에선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선 건설업이 가장 많고 이외 사업시설 관리,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그림 2]는 복귀 일자리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6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모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순으로 많았지만 60대 이상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연령에 따른 복귀 일자리 특성: 업종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림 2
연령에 따른 복귀 일자리 특성: 직종
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2. DID 및 DDD 분석 결과
1)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
<표 8>은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직업 복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직업 복귀 노동자와 미복귀 노동자 간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차이가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 시점 변수는 모형1에선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형2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양적 효과를 미쳤다. 이 결과는 1차 조사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요양 종결 산재 노동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직업복귀의 건강 효과 분석: 미복귀-복귀(전체)
| 모형1 | 모형2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상생활 수행능력 | |
| 직업복귀 | 0.0728 | 0.143 |
| (0.0629) | (0.0803) | |
| 시점 | 0.0260 | 0.229* |
| (0.0670) | (0.0936) | |
| 시점##직업복귀 | 0.270*** | 0.0760 |
| (0.0755) | (0.107) | |
| 60대 이상 | 0.145 | |
| (0.0951) | ||
| 시점##60대 이상 | -0.475*** | |
| (0.111) | ||
| 직업복귀##60대 이상 | -0.175 | |
| (0.127) | ||
| 시점##직업복귀##60대 이상 | 0.437** | |
| (0.148) | ||
| Constant | -0.558 | -0.576 |
| (0.359) | (0.354) | |
| Observations | 1,302 | 1,302 |
| R-squared | 0.166 | 0.177 |
한편 직업 (미)복귀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과 직업복귀 상호작용항의 값은 0.2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3]에 한계효과 그래프를 그렸다. [그림 3]을 살펴보면 미복귀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1차 조사 때에 비해 3차 조사 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복귀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뚜렷하게 증가한(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2에서는 직업 복귀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 효과가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중 차분 변수(직업 복귀 × 시점 × 연령)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 복귀와 시점과 연령 상호작용항의 값은 0.4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해, 직업 복귀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강한 양적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그림 4]를 살펴보면 60대 미만의 경우 직업 복귀 노동자와 미복귀 노동자가 모두 1차보다 3차 조사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증가하였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직업 복귀 노동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증가하고 미복귀 노동자는 오히려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 비정규직 복귀와 고용 형태 불안정화 복귀 추가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양적 효과를 미치며, 그 효과는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직업 복귀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비정규직으로 직업 복귀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미할까?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혜경 외, 2009; 이주희, 김명희, 2015; 신희주, 2017; 안준희, 2017). 이 점에 주목해 본 연구는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실험군은 <표 8>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차 조사때 직업 미복귀 노동자였다가 2차와 3차 조사에서 연속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한 노동자이다. 대조군은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계속해서 직업 미복귀 상태에 머무른 노동자이다.
<표 9>는 비정규직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나타낸다. 직업 복귀 변수는 모형1과 모형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시점 변수는 모형2에서만 양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8>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비정규직 직업 복귀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시점과 직업복귀 상호작용항은 모형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삼중 차분 변수(시점×직업복귀×60대 이상)는 유의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직업 복귀의 일상생할 수행 능력 회복 효과를 한계 효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비정규직 직업 복귀 집단과 직업 미복귀 집단은 1차 조사 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3차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직업 복귀 집단은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직업 미복귀 집단은 소폭 감소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직업 복귀 역시 미복귀와 비교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직업복귀의 건강 효과 분석: 미복귀-비정규직 복귀
| 모형1 | 모형2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상생활 수행능력 | |
| 직업복귀 | 0.0416 | 0.108 |
| (0.0765) | (0.105) | |
| 시점 | -0.0259 | 0.221* |
| (0.0705) | (0.109) | |
| 시점##직업복귀 | 0.341*** | 0.151 |
| (0.0884) | (0.135) | |
| 60대 이상 | 0.119 | |
| (0.103) | ||
| 시점##60대 이상 | -0.473*** | |
| (0.125) | ||
| 직업복귀##60대 이상 | -0.112 | |
| (0.153) | ||
| 시점##직업복귀##60대 이상 | 0.315 | |
| (0.178) | ||
| Constant | -0.450 | -0.460 |
| (0.431) | (0.415) | |
| Observations | 1,029 | 1,029 |
| R-squared | 0.134 | 0.145 |
다음으로 재해 당시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로 직업 복귀하는 것도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양적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도 진행하였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뿐 아니라 고용 상태의 변화, 특히 불안정화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변금선, 이혜원, 2018; 박세홍 외, 2009; 박진욱 외, 2007). 실험군은 1차 조사 때 직업 미복귀 상태였다가 2차와 3차 조사에서 연속으로 재해 당시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직업 복귀 상태를 유지한 집단이다. 대조군은 1차부터 3차 조사까지 연속해서 직업 미복귀 상태인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표 9>의 비정규직 복귀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표 10>의 고용 형태 불안정화는 재해 당시 정규직이었던 산재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를 뜻한다.
표 10
직업복귀의 건강 효과 분석: 미복귀-고용형태 불안정화 복귀
| 모형1 | 모형2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상생활 수행능력 | |
| 직업복귀 | -0.0577 | -0.0592 |
| (0.0619) | (0.0836) | |
| 시점 | 0.0501 | 0.291** |
| (0.0651) | (0.0964) | |
| 시점##직업복귀 | 0.155 | -0.0915 |
| (0.0841) | (0.134) | |
| 60대 이상 | 0.0863 | |
| (0.0903) | ||
| 시점##60대 이상 | -0.447*** | |
| (0.110) | ||
| 직업복귀##60대 이상 | 0.0292 | |
| (0.124) | ||
| 시점##직업복귀##60대 이상 | 0.421* | |
| (0.174) | ||
| Constant | -0.855* | -0.891* |
| (0.383) | (0.383) | |
| Observations | 1,164 | 1,164 |
| R-squared | 0.137 | 0.151 |
<표 10>은 고용 형태 불안정화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재해 당시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직업복귀 하는 것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시점과 상호작용항은 모형1과 모형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모형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령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삼중 차분(시점×직업복귀×60대 이상) 변수의 값은 0.4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6]을 그렸다. [그림 6]을 살펴보면 60대 미만 산재 노동자의 경우 미복귀/고용 형태 불안정화 직업 복귀 두 집단에서 모두 1차 대비 3차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미복귀 노동자는 1차보다 대비 3차 조사 때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였고, 고용 형태 불안정화 직업 복귀 노동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증가해 회복의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60대 이상 고령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는 복귀 일자리의 질보다 복귀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직업 복귀 성과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실업과 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의 연장에 있으나,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겪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할 경우, 직업 미복귀가 중층적 박탈을 야기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겪은 산재 노동자가 신체 부담이 높은 일자리로 복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비자발적 실업의 건강 효과를 분석할 때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직업 복귀는 건강 측면에서 권장될 만한 것일까? 연구 결과, 직업 미복귀는 산재 노동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회복에 부적 효과를 가졌고, 그 효과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령층에게 업무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퇴장은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겪은 후 다시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건강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령 산재 노동자는 재해 당시에도 신체 부담이 높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 종결 이후에 직업 복귀를 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신체 부담이 높은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보다 고령 산재 노동자가 신체 부담이 낮은 직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신체 부담이 낮은 직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뿐 아니라 사회 관계, 신체 활동, 의료 접근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고령층은 직업 생활에 사회 관계와 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노동시장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비자발적 퇴직이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오혜인 외, 2014; 이상철, 조준영, 2017; Cornwell & Waite, 2009; Hawton et al., 2011; Steptoe, 2013).
본 연구의 한계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분석 자료 상의 한계로 1차 조사 당시 직업 미복귀자만을 대상으로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인과적 분석을 위해, 복귀 이전과 복귀 이후 건강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집단만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업 복귀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 집단 내에서만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 미복귀의 건강 효과가 고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직업 미복귀로 인해 중첩적 발탈이 신체 허약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나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진 못 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선 직업 미복귀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본 연구가 건강이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를 부정하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밝힌다. 오히려 본 연구는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배제가- 특히 고령층에서-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즉 건강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가 순환적임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 복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이 접근하게 되는 사회적·심리적·물질적 자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이 건강 형성과 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Appendices
Notes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차 조사와 3차 조사를 비교한 이유는 2차 혹은 4,5차 조사와 비교하는 것보다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조사의 경우, 취업 기간이 짧아 직업 복귀가 건강 회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4차, 5차 조사의 경우, 이 시점까지 연속으로 취업하지 못한 산재 노동자와 취업한 산재 노동자(1차 제외) 간 이질성이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선택 편향을 줄이기 위해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두 집단의 기초적인 특성이 너무 다르면 직업복귀의 인과적 건강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1차 조사 직업 미복귀자 중 2차, 3차 연속 취업 산재 노동자와 연속 미취업 노동자 간의 건강 회복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연구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와 재해 당시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가 산재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때 실험군은 각각 비정규직 복귀 노동자와 고용 불안정화 복귀 노동자이고, 대조군은 미복귀 노동자이다. 전체 직업 복귀의 건강 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커널 매칭 기반 성향 점수 가중치를 생성하고 이중·삼중 차분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매칭 결과 β 값과 R값은 모두 기준 범위 내에 있어 공변량 균형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세한 결과는 부도 1과 부표 1을 참조).
References
, & (2012). Effenct of job loss due to plant closure on Mortality and Hospitalizat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1(4), 599-616. [PubMed]
, , , , , , , , , , &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6(3), 146-157. [PubMed]
, , , , , , & (2011).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on the health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Quality of Life Research, 20(1), 57-67. [PubMed]
, , & (2009). The public health costs of job loss. Journal of Health Economic, 28(6), 1099-111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28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10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7-30

- 215Download
- 688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