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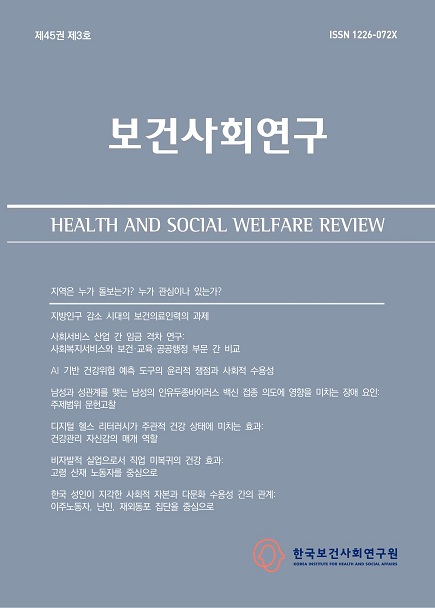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 예측요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Predictors of Emotions in Staff Supporting Challenging Behavior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Decision Tree Analysis
Kim, Miok1; Kim, Goeun2*; Jung, Eunhye3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334-356,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334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도전행동의 빈도와 강도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개인 특성, 조직 환경, 개입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감정 유발 요인을 단순 인과관계가 아닌 예측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도전행동의 발생 빈도, 신체적 개입 정도, 교육 경험, 개인별 행동지원 계획 유무, 상해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예측된다. 특히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단순히 도전행동의 유무나 강도의 영향이 아니라 교육의 부족,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 반복되는 상해 경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종사자의 감정을 도전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감정 인식과 조절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과 팀 기반의 비신체적 개입 전략을 구축하고,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전행동 발생 후에는 디브리핑과 같은 정서적 지원 체계를 정례화하여 종사자의 감정 소진을 예방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종사자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하고 심리상담과 휴식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요구된다.
Abstract
a high proportion of users exhibiting challenging behaviors, frequent daily challenging behaviors, and limited training. Even when ample training was provided, staff members who had frequent experiences of injury reported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Additionally, staff in institutions with lower proportions of users showing challenging behaviors but with frequent physical interventions, frequent injury experiences, and a lack of individualized behavior support plans also reported higher negative emotions. These findings identify key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mong staff supporting challenging behavior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effective support strategies.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감정 예측요인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직관적 해석에 용이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나타나는 이용자가 많으며 교육이 적은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교육을 다수 제공하더라도 종사자 상해경험이 많으면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아도 신체적 개입을 많이 수행하거나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종사자 상해 경험이 잦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의 집단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도전행동 지원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Ⅰ. 연구의 필요성
흔히 사회복지를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면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사회복지의 전문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용자와의 긍정적 관계, 서비스 성공 경험 등은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처럼 자해나 타해로 종사자가 빈번한 상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두려움과 분노, 우울 등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고, 이는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시 전문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감정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무수히 많은 자극들은 감정을 유발하고,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에 주목하는 실천 현장에서 종사자의 감정조절은 대면업무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점점 강조되고 있다(Milton, 2005). 감정은 행동에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행동하려는 경향과 준비, 그리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Zhu & Thagard, 2002). 이에 상황에 대한 특정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유발과 감정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행동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따라 행동 패턴이 달라지고 감정이 의사결정에도 의미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돌봄 행위나 서비스 지원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전행동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Weiner(1986)의 돌봄 행동 Attribution Model에 의하면 돌봄 상황에 대한 해석이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지원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감정이 서비스 지원행동에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이 이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서비스 지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은 종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내심, 전문성, 정서적 민감성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감정을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Reyes-Martin et al., 2024).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전행동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종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다각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71%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도전행동을 나타내고, 종사자의 53%는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Bailey et al., 2006). 도전행동은 자해, 타해, 기물파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적 위협을 수반할 수 있고 반복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종사자에게 큰 정서적 부담을 준다(Rose et al., 2004).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은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지 않는다. 이 감정은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방식, 태도, 대응전략에 직결되어 이용자의 삶의 질,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Lokman et al., 2024, Hastings, 2002).
도전행동 지원과정에서 종사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스트레스, 좌절감, 불안, 분노, 무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복합적인 부정적 감정은 도전행동 지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stings & Brown 2002; Reyes-Martin et al., 2024). 도전행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면 종사자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거나 비효율적 일 수 있고, 이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Zijlmans et al., 2013; Bromley & Emerson, 1995). 감정적으로 안정된 종사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도전행동에 대응하게 된다(Mitchell & Hastings, 2001). 부정적인 감정 압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누적될 경우 감정 소진, 피로, 직무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질병까지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직이나 직무 회피, 낮은 서비스 질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Paris et al., 2021). 도전행동 지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감정 관리와 지원은 도전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 관리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전행동 상황에서 종사자가 경험하는 감정은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기 어렵다. 도전행동의 빈도, 강도, 유형은 물론, 종사자의 경력, 조직 지원, 감정조절능력, 개입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종사자의 감정 상태를 결정짓는다. 즉, 감정노동의 예측요인은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된 모형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떤 요인이 종사자의 감정을 유발하는지를 예측 기반으로 탐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Baker와 Gore(2019)도 도전행동과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은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개인적 요인이 도전행동의 영향을 완화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도전행동 특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는데, 도전행동의 빈도와 강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할수록 종사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Klaver et al., 2021; Paris et al., 2021; Stanley & Standen, 2000). 또한 이용자의 행동 자체보다는 도전행동의 개입방식과 종사자의 전문성 등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개입방식은 단순히 대상자의 행동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정서 상태와 심리적 소진 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Allen et al., 2005, McDonnell, 2010).
이처럼 도전행동에 직면하는 종사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고 절적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행동 지원과 종사자의 감정에 대한 인식 및 체계적인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 자체도 미비하고 감정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도 부족하다(Lokman et al., 2024). 국내 선행연구들은 도전행동 자체의 특성과 지원 방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고, 종사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종사자의 인식과 태도, 지식 등에 초점을 두어 시행되고 있어 감정과의 연관성은 미비한 상황이다.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이나 도전행동 지원 교육에서 감정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감정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 특성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높이는 요인들을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은 어떤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예측되는가’이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분류와 예측에 용이하고, 변수들의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하여 나무모양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해석이 쉬운 설명을 제시해준다. 국내에서는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인과관계 확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측요인들을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시설 특성 때문이다. 주간이용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여타의 장애 관련 사회서비스에 비해 예산이 적고 종사자 대 이용자 비율이 높아 이용자 돌봄에 어려움이 크며, 중증장애인 이용자가 다수로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종사자의 감정 연구에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비록 이 연구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장애인복지실천 종사자를 대상으로 후속연구들이 시행되어, 종사자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Ⅱ. 문헌고찰
1.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지원에서의 종사자 감정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도전행동은 단순히 문제행동으로 치부되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수단 또는 욕구나 불편함을 반영하는 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도전 행동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도전행동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도전행동은 종종 자해, 타해, 사회적 부적응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데(Emerson & Einfeld, 2011), 도전행동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30~60% 가까이가 도전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Bowring et al., 2017, Nicholls et al., 2020). 이러한 행동은 당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인내심과 감정 조절 능력이 요구된다. 도전행동은 예측이 어렵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신체적 위협을 수반하기도 하여 종사자는 업무 중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Reyes-Martin et al., 2024). 종사자들은 도전행동 지원과정에서 타해의 대상으로 빈번히 맞거나 상해를 입기도 하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의 반복되는 도전행동에 대한 노출은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이직 의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Gray-Stanley & Muramatsu, 2011).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는 도전행동 자체의 원인이나 중재 전략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인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종사자들은 슬픔, 절망, 분노, 짜증, 두려움 및 혐오감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된다(Bromley & Emerson, 1995, Paris et al., 2021). Hastings(2004)의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25%~35%가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감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은 단지 개인의 감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감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식, 태도, 대응전략에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친다(Hastings, 2002).
특히 도전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어 비전문적 대응, 신체적 개입 사용 증가, 이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관계 형성 실패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Paris et al., 2021, Reyes-Martin et al., 2024). 부정적 감정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전행동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Emerson, 2001), 높은 이직률과 직무 회피 경향을 보이게 한다. 이러한 감정적 소진으로 인한 종사자의 현장 이탈은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 또한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종사자들의 질병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시키게 된다(Bianchi et al., 2015). Hastings와 Brown(2002)은 도전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종사자들이 높은 수준의 분노, 소진, 회피 행동을 보이며, 업무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 현장 종사자의 감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에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서비스의 환경이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도전행동이 발생하여 종사자에게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또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도전행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Rose & Rose, 2005). 실제로 돌봄 종사자의 53%는 자신의 감정이 발달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Montañés Muro et al., 2022). White 등(2003)은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Flynn 등(2018)은 도전행동에 많이 노출된 종사자는 심리적 고통이 커져 이용자의 도전행동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Willems 등(2015)도 불안과 분노와 같은 종사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용자에 대해 더욱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은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행동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종사자 감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Mitchell과 Hastings(1998)는 도전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두려움, 분노, 좌절, 혐오감, 긴장감 등을 확인하는 도전행동 감정적 반응 척도(Emotional Reactions to Aggressive Challenging Behavior Scale, ERCBS)를 개발했다. 이후 Jones와 Hastings(2003)는 긍정적 감정까지 확장하여 평가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쾌활함/흥분, 자신감/편안함의 긍정적 감정과 우울함/분노, 두려움/불안의 부정적 감정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외국에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사자의 감정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도전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감정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김영희(2020)의 연구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폭력경험 연구를 통해 도전행동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당혹감, 두려움, 자책감, 무력감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종사자들은 제도적 안전망과 회복을 위한 기관의 대처 부족으로 심리적 낙담이나 상흔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양적연구로 종사자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이 소수로 진행되었고(이병화, 이미영, 2018, 김성중, 2018), 김고은(2021)의 장애인복지 종사자 대상 도전행동 지원교육의 효과성 연구에서 종사자의 감정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에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김미옥 외, 2017, 김미옥 외, 2024) 종사자의 감정에 집중하여 이를 학술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에 주목하고 특히,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지원 종사자의 감정 관련 요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종사자의 감정적 반응이 도전행동 노출과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소진 사이에서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감정과 관련된 더 확장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조직 내 지지 체계,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감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도전행동에 대한 종사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적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인 현실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요인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다. 즉, 도전행동의 유형, 빈도, 강도는 종사자의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astings(1995)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짜증, 분노,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자해에 대해서는 슬픔, 절망, 분노, 혐오감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해 및 공격적, 파괴적 행동의 심각성과 빈도는 종사자의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Lambrechts & Maes(2012) 의 연구에서도 12명의 종사자에게 도전행동 대응을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며 감정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도전행동의 빈도와 부정적 감정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Stanley과Standen(2000)은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간서비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는데 도전행동이 심하고 타인에 대해 공격적일수록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Klaver 등(2021)도 도전행동의 노출 빈도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밝혀 도전행동의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관련성이 보고된다. 그러나 반대로 도전행동의 특성과 감정 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여, 감정의 발생이 단순히 행동의 속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합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동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종사자의 특성 및 조직적 조건과의 상호작용까지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방법과 부정적 감정의 관련성도 보고된다. 도전행동 지원은 예방전략과 대응전략으로 구분되는데, 도전행동을 지원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종사자가 느끼는 불안감, 무력감, 스트레스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방전략이나 긍정적 행동 지원시에는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이 낮아진다(Gray-Stanley & Muramatsu, 2011). 한편 도전행동 발생시 발달장애인을 통제하거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신체적 개입은 종사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안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개입 전략이라고 보고된다. 특히 신체적 개입 중 상해의 발생은 공포나 분노 등의 감정을 유발하여 트라우마와 연결될 수 있고 대응 회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입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Mitchell & Hastings, 2001). 이처럼 개입 방식은 종사자의 감정 반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입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유발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개입 전략이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그 예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수준은 도전행동에 대한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도전행동 관련 종사자 교육이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도전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전행동에 직면할 경우 종사자는 개인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무력감, 불안, 회피 등을 느낄 수 있다. 충분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 경험이 있는 경우 도전행동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전행동에 대한 교육이 부정적 감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McDonnell, 2010). 이는 도전행동에 대한 태도, 지식, 기술 등의 전문성을 높여 감정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도전행동에 대한 감정을 살펴본 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감정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경 외, 2015). 또한 행동지원계획과의 연관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면 대응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감 등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원계획 실행에 대한 부담이나 계획이 현실에 적용이 안될 경우 종사자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인지상태에 따라 종사자의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발달장애인의 관계와 부정적인 감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있으나 소수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어 탐색적으로 도전행동 지원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Montañés et al., 2022, Lambrechts et al., 2010). 기존 연구들이 특정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종사자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의 예측요인이 어떻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 관리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이다. 조사 당시(2023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이 2024년부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개정되어(보건복지부, 2024),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최중증장애인 전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도입연구’(김미옥 외, 2023)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조사 당시, 한국장애인주간 보호시설협회)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안내를 발송하였고, 설문지에는 설문의 취지와 연구 목적, 비밀 보장, 설문 예상시간 등의 안내를 포함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9일~11월 7일이었다. 모집된 데이터 중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응답 등을 확인하여 정리한 후 최종 305개소 시설의 종사자 응답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이용자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발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연구들이 증가추세이나, 종사자의 감정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직관적인 해석을 밝히고자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도전행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보이는 집단의 특성을 분류를 통해 제시하였다.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나무 도표를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김덕현 외, 2019),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주제에서 주요 변수의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가 근무하는 주간이용시설 및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의 정보와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를 빈도분석으로 제시하였으며, 시설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인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의 평균값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후 도전행동 지원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과 예측요인들은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변수의 특성을 사전 확인하여 이지분리(Binarty recursive partitioning) 후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알고리즘은 비모수적 방법으로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통계패키지는 SPSS 26을 사용하였다. CART는 분류 및 예측을 위해 데이터를 이지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누는 분석법이며, 변수의 분포나 복잡한 상호작용에 관한 가정 없이 데이터의 구조적 패턴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므로 사회과학 분야에 적합하다(Roger & Lewis, 2000). 탐색적인 연구와 결측값이 있는 자료에서도 유용성을 보이고 있어(Kuhn & Johnson, 2019), 결측값이 일부 존재하는 본 조사 자료를 탐색적 연구로 활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패키지 SPSS 26에서는 CART의 결측값 처리 방법인 대리 분할(Surrogate splits)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대리 분할은 의사결정 나무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을 때, 다른 대체 예측 변수를 사용하여 관측치의 자식노드1)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 단순 목록 삭제보다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Rodgers et al, 2021; Kuhn & Johnson, 2019). CART 분석에서 최대깊이는 노드의 수와 모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깊이를 4로 지정하였으며, 최소 케이스 수는 상위노드가 전체 케이스 수의 10% 수준인 30, 하위노드는 상위노드의 50%인 15로 제한하였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가. 도전행동 지원 종사자의 감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은 단순히 도전행동에 관한 감정이 아니라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직접 지원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특히 도전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였다. 이를 측정하고자 Mitchell과 Hastings(1998)가 개발한 도전행동에 관한 감정 반응 척도(Emotional Reactions to Aggressive Challenging Behavior Scale, ERCBS) 중 대표 문항으로 우울함/분노 영역에서 화, 슬픔, 혐오감을 두려움/불안 영역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선택하여 총 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질문내용에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감정 수준”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문항 평균값의 응답자 전체 평균을 확인한 결과 3.02점으로 중간값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지분리를 활용하는 CART의 특성에 적합한 변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전체 평균값인 3.02점 이상 집단을 부정적 감정이 높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나. 도전행동 지원 종사자의 감정 예측 요인
도전행동 지원 종사자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 예측 요인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도전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소속된 주간이용시설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 요인과 도전행동 지원 요인, 도전행동 전문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1)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 요인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 요인으로는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과 도전행동 빈도가 높은 이용자 수를 확인하였다.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이용자 수 대비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확인한 것이며, 도전행동 빈도가 높은 이용자 수는 각 이용자들의 도전행동 빈도를 확인하여 빈도가 높은 이용자가 기관에 몇 명 있는지 수치화 한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도전행동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도전행동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이용자 수와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수를 확인하고 있어,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이용자 수 대비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수의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이지분리를 위한 기준은 중간값인 50%를 활용하였으며, 50% 이상인 기관은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상대적으로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낮은 기관으로 판단하였다.
도전행동 빈도는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4회, 매일 1~2회, 매일 3회 이상,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이용자 수를 확인하였다. 응답 중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수보다 많은 수의 응답이 표시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결측으로 처리하였으며, 총 31건 발견되었다. 이 중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매일 1~2회, 매일 3회 이상) 수를 확인하였는데, 기관 평균 2.97명으로 나타나 3명을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을 나누어 확인하였다.
2) 도전행동 지원 요인
도전행동 지원 요인은 도전행동을 지원하면서 신체적 개입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지원 과정에서 기관 종사자가 상해를 입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신체적 개입은 이용자가 도전행동을 보일 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제지하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통한 자해제지, 신체접촉을 통한 타해제지, 이용자가 착용한 안전장비에 직접 손을 대서 제지, 종사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신체접촉을 통한 개입을 하는 4가지 신체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이 중 4가지 신체적 개입을 모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일부 신체적 개입만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로 분류하여 투입하였다.
도전행동 지원 중 발생하는 종사자 상해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상해 빈도를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예시로 매달 2~3회, 1년 3~4회 등을 제시하였다. 내용 분석을 통해 1달에 1회 미만인 기관과 1달에 1회 이상인 기관으로 분류하였고, 1개소는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지 않아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3) 도전행동 전문성 요인
도전행동 전문성 요인은 종사자에게 발달장애 및 도전행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시행 수준과 전문성 있는 도전행동 지원을 위해 기관에서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교육은 주간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중 발달장애 및 도전행동과 관련된 주요 교육들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교육은 도전행동 이해, 발달장애인 특성 및 가치기반 접근, 의사소통, 유능한 환경, 개인별 행동지원계획 수립, 예방 및 중재전략 수립,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안전한 환경 구축, 신체적 개입 및 위기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안전관리, 긍정적 행동지원의 10개 교육 시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중간값을 기준으로 5개 이하의 교육을 제공한 기관과 6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 기관을 나누어 확인하였다.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은 도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와는 차별성있는 전문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서, 모든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를 위해 세운 기관 뿐 아니라 일부 도전행동이 심한 이용자를 위해 계획을 세운 기관도 포함하여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한 기관으로 보았다. 도전행동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는 기관은 미수립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 및 이용자 현황
가. 시설의 일반적 현황
응답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106명, 비수도권에 199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단독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의 기관 부설이나 개인시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부설이라하더라도 본 기관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복합 설치, 운영이 가능하지만 인사와 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5). 응답자의 근무시설은 단독시설이 146개소(47.9%)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부설이 77개소(25%) 수준이었다. 이용자 수는 11~12명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15~16명 수준의 기관도 20.3%로 나타났다.
시설 면적은 100㎡이하의 소규모부터 300㎡초과의 대규모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150㎡ 이하의 규모가 49.8%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2025)에서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중 시설 환경의 공간 구성에서 정원에 맞는 공간 확보를 위해 1인당 9.9㎡를 권장하고 있으며, 종사자 관련 사항에서는 사회재활교사를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조사가 수행된 시점인 2023년에도 동일하였다. 하지만 공간은 1인당 면적이 9.9㎡ 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41.6% 수준이었으며, 종사자 1인 당 이용자 수는 3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120개소(39%)나 되었다.
1인 당 이용자 수는 2021년까지 4인당 1인이 기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인 2023년에는 이전의 이용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응답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시설의 일반적 현황
(N=305개소, 단위: 개소, %)
| 구분 | 빈도 | 비율 | 구분 | 빈도 | 비율 | ||
|---|---|---|---|---|---|---|---|
| 지역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06 | 34.8 | 시설 면적 | 100㎡ 이하 | 73 | 23.9 |
| 비수도권 | 199 | 65.2 | ~ 150㎡ | 79 | 25.9 | ||
| 시설 형태 | 단독시설 | 146 | 47.9 | ~ 200㎡ | 55 | 18.0 | |
| 장애인복지관 부설 | 48 | 15.7 | ~ 300㎡ | 44 | 14.4 | ||
| 종합복지관 부설 | 29 | 9.5 | ~ 300㎡ 초과 | 54 | 17.7 | ||
| 기타 부설 | 48 | 15.7 | 이용자 1인당 면적 | 9.9㎡ 미만 | 127 | 41.6 | |
| 개인시설 | 34 | 11.1 | 9.9 ㎡ 이상 | 178 | 58.4 | ||
| 이용자 수 | 10명이하 | 36 | 11.8 |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 | 1명 이하 | 3 | 1 |
| 11~12명 | 92 | 30.2 | ~ 1.5명 | 17 | 5.6 | ||
| 13~14명 | 37 | 12.1 | ~ 2명 | 23 | 7.5 | ||
| 15~16명 | 62 | 20.3 | ~ 2.5명 | 48 | 15.7 | ||
| 17~18명 | 27 | 8.9 | ~ 3명 | 94 | 30.8 | ||
| 19~20명 | 14 | 4.6 | ~ 3.5명 | 31 | 10.2 | ||
| 21~30명 | 32 | 10.5 | ~ 4명 | 46 | 15.1 | ||
| 31명 이상 | 5 | 1.6 | 4명 초과 | 43 | 14.1 | ||
나. 시설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현황
응답한 305개소 시설의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수는 총 1,806명으로 시설 내 평균은 5.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상생활에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732명으로 40.5% 수준이었다. 도전행동의 빈도는 응답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하고 274개소 1,65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월 1회 미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0% 수준이 주 1회 이상의 도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도전행동 유형은 각 시설마다 해당 도전행동 유형을 보이는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자해행동은 전체 응답 기관의 90.8%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타해행동도 84.3%로 나타났다.
표 2
시설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특성
(305개소 기준)
| 구분 | 전체 시설 이용자 수(%) | 시설 내 평균 이용자 수(SD) | 구분 | 빈도 (단위:개소) | 비율 (단위:%) | ||
|---|---|---|---|---|---|---|---|
|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수 | 1,806(100.0) | 5.92(3.96) | 도전 행동 유형 | 자해행동 | 277 | 90.8 | |
| 위 이용자 중 일상생활에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수 | 732(40.5) | 2.40(3.80) | 타해행동 | 257 | 84.3 | ||
| 성행동 | 184 | 60.3 | |||||
| (274개소 1,650명) | 월 1회미만 | 130(7.9) | .47(1.31) | 집착행동 | 215 | 70.5 | |
| 월 1~3회 | 225(13.6) | .82(1.33) | 안전위협행동 | 150 | 49.2 | ||
| 주 1~4회 | 453(27.5) | 1.65(1.97) | 기물파손행동 | 158 | 51.8 | ||
| 매일 1~2회 | 391(23.7) | 1.43(1.99) | 물건훔치기 | 77 | 25.2 | ||
| 매일 3회 이상 | 422(25.6) | 1.54(2.56) | 거식·폭식 행동 | 70 | 23.0 | ||
| 무응답 | 29(1.8) | .11(1.12) | 배변관련강박행동 | 107 | 35.1 |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3세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현 직장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근무경력은 평균 7년 1개월 수준이고, 5년~10년 미만이 28.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5%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원 재학 이상의 비율도 30.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
응답자(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빈도(단위:명) | 비율(단위:%) | 구분 | 빈도(단위:명) | 비율(단위:%) | ||
|---|---|---|---|---|---|---|---|
| 성별 | 남자 | 101 | 33.1 | 연령 | 20~29세 | 22 | 7.2 |
| 여자 | 204 | 66.9 | 30~39세 | 81 | 26.6 | ||
| 현직장 근무경력 | 1년 미만 | 26 | 8.5 | 40~49세 | 129 | 42.3 | |
| 1년~3년 미만 | 60 | 19.7 | 50~59세 | 67 | 22.0 | ||
| 3년~5년 미만 | 47 | 15.4 | 60~65세 | 6 | 2.0 | ||
| 5년~10년 미만 | 86 | 28.2 | 최종 학력 | 전문대학 졸업 | 52 | 17.0 | |
| 10년~15년 미만 | 57 | 18.7 | 대학교(4년제) 졸업 | 160 | 52.5 | ||
| 15년 이상 | 29 | 9.5 | 대학원(재학) 이상 | 93 | 30.5 | ||
3. 주요 변수의 현황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감정은 5점 척도 5문항 평균값인 3.02점 이었고, 해당 값이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시설형태 (단독 및 개인, 부설), 시설규모(이용자 수 15명 미만, 15명 이상)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을 기준으로 종사자의 감정을 구분한 결과 부정적 감정이 낮은 집단(평균 미만)이 166명, 54.4%로 부정적 감정이 높은 집단(139명, 45.6%)보다 약간 많았다.
예측요인 중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은 50% 미만이 많았으며,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는 3인 이상에 비해 3인 미만이 많았다. 신체적 개입은 모든 개입을 수행하기보다 일부 개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았고,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은 1달에 1회 미만이 1달에 1회 이상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은 수립한 기관이 많았으며, 기관 내 발달장애인 및 도전행동 관련 교육은 6개 이상 시행한 기관이 다수였다.
변수의 측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는 응답 오류로 인한 결측이 10.2% 수준이었으며,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 빈도에서도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응답이 1건 존재하여 0.3% 수준의 결측이 있었다. 그 외의 자료에서는 결측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주요 변수의 현황
| 주요 변수 | 구분 | 빈도 | 비율(단위:%) | ||
|---|---|---|---|---|---|
| 종속 변수 |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감정 (평균 : 3.02, 표준편차 : .89) | 부정적 감정 낮음(평균 미만) | 166 | 54.4 | |
| 부정적 감정 높음(평균 이상) | 139 | 45.6 | |||
| 예측 요인 |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 요인 |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 | 50% 미만 | 211 | 69.2 |
| 50% 이상 | 94 | 30.8 | |||
|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 3인 미만 | 158 | 51.8 | ||
| 3인 이상 | 116 | 38.0 | |||
| 결측 | 31 | 10.2 | |||
| 도전행동 지원 요인 | 신체적 개입(4개 영역) | 일부 개입 수행 | 283 | 92.8 | |
| 모든 개입 수행 | 22 | 7.2 | |||
|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 빈도 | 1달에 1회 미만 | 169 | 55.4 | ||
| 1달에 1회 이상 | 135 | 44.3 | |||
| 결측 | 1 | .3 | |||
| 도전행동 전문성 요인 | 기관 내 발달장애인 및 도전행동 관련 교육 시행(10개 영역) | 5개 이하 시행 | 64 | 21.0 | |
| 6개 이상 시행 | 229 | 75.1 | |||
| 개인별 행동지원계획 | 미수립 | 77 | 25.2 | ||
| 수립 | 228 | 74.8 | |||
4.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의 예측 요인 확인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CAR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분리기준은 지니 계수(Gini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가시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상위노드, 하위노드의 사례 수는 30과 15로 설정하였으며, 최대깊이는 4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위험도표를 확인한 결과, 정밀도 62.1%, 민감도 75.9%, 특이도 44.6%로 전체 분류정확도는 61.6%였으며, 위험 추정치가 .384로 오분류율이 38.4%로 나타났다.
한편 CART는 오분류율 외에도 다양한 성능 평가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 중 F1 점수(F1 Score)는 정밀도와 민감도의 조화평균을 검증한 지표로서 불균형 자료에서 유용한 지수이며 0.5~0.8 수준이면 보통의 지표로 판단하고, 계산법은 아래의 수식과 같다(eNCORD, 2023).
이를 적용하여 이 분석의 F1 점수를 계산한 결과 0.68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 모형에서 오분류율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한 오분류율인 41.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F1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문사회 영역의 연구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5
모형의 위험도표
| 분류 | 예측분류 | ||
|---|---|---|---|
| 부정적 감정 낮음 | 부정적 감정 높음 | 정확도 | |
| 부정적감정낮음 | 126 | 40 | 75.9% (민감도) |
| 부정적감정높음 | 77 | 62 | 44.6% (특이도) |
| 전체비율 | 66.6% | 33.4% | 61.6% |
| 위험추정치(표준오차) | .384(.028) | ||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나무도표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 비율은 45.6%이었으며, 부정적 감정이 낮은 응답자 비율은 54.4%로 분포하고 있다(노드0). 도전행동 지원에서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무하는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집단(노드1)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41.2%로 4.4% 감소하였으나, 근무하는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집단(노드2)은 55.3%로 9.7% 증가하였다.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은 집단 중 4가지 유형의 신체적 개입을 모두 수행하는 집단(노드4)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의 비율이 62.5%로 전체 비율에 비하여 16.9% 증가하였으며, 일부만 수행하는 집단(노드3)은 39.5% 로 6.1% 감소하였다. 해당 집단에서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노드8)이면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가 44.2%로 전체 집단의 비율보다는 1.4% 감소하였으나 부모노드보다는 4.7% 증가하였고, 상해경험 빈도가 1달에 1회 미만인 집단(노드7)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가 36.4%로 전체 비율보다 9.2% 감소하였다.
기관 내에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더라도,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가 적은 기관(노드6)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44.4%로 전체 집단의 비율보다 1.2% 감소하였다. 기관 내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도 많은 집단에서 발달장애 및 도전행동 관련 교육을 적게 제공하면(노드9)에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가 66.7%로 나타나 전체 집단의 비율보다 21.1%나 높았다. 교육을 많이 제공하면(노드10) 부정적 감정이 높은 응답자 비율이 57.1%로 전체 비율보다는 높았지만 부모노드에 비해서는 2.6% 감소하였으며, 이 집단에서 상해 경험 빈도가 낮으면(노드15) 52.0%로 5.1% 추가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관 내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고,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며,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 빈도가 1달에 1회 미만인 집단에서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면(노드11)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39.8%, 수립하지 않으면(노드12) 28.6%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전체 비율인 45.6%에 비해 5%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고,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지만, 기관 내 종사자 상해경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인 집단(노드8)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높은 비율이 44.2%로 부모노드에 비해 4.7% 증가하였으며, 해당 집단 중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한 기관(노드13)은 37.9%, 수립하지 않은 기관(노드14)은 63.2%가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비율과 비교했을 때 수립한 기관은 7.7% 감소, 수립하지 않은 기관은 1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마지막 노드는 9개로 나타났으며, 각 노드별 특징을 설명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중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노드(노드4, 노드9, 노드14, 노드16)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비율이 높았던 노드9와 62.5% 수준을 보인 노드16은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가 많다는 기관 현황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노드9는 교육이 적은 기관의 종사자, 노드16은 교육은 많지만 상해경험이 많은 기관의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전행동에 자주 노출되는 기관 환경 특성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과 결합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도전행동으로 인한 종사자 상해가 자주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상황이 고려되면서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드4와 노드14는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낮지만 노드4의 종사자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드14는 신체적 개입은 일부만 수행하지만 기관 내 종사자 상해 경험이 잦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미수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도전행동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측변인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신체적 개입이 많거나 신체적 개입이 적더라도 종사자 상해 경험이 잦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을 갖는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마지막 노드 특성 요약
| 노드 | 사례수 |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 | 집단 특징 |
|---|---|---|---|
| 노드4 | 16 | 62.5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은 낮지만(50% 미만), |
| 모든 신체적 개입을 수행하는 종사자 | |||
|
|
|||
| 노드6 | 27 | 44.4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고(50% 이상), |
|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가 적은(3인 미만) 기관의 종사자 | |||
|
|
|||
| 노드9 | 18 | 66.7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으며(50% 이상), |
|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가 많고(3인 이상) | |||
|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이 적은(10개 중 5개 이하) 기관의 종사자 | |||
|
|
|||
| 노드11 | 83 | 39.8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은 낮고(50% 미만), |
|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면서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미만이고 | |||
|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
|
|
|||
| 노드12 | 35 | 28.6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은 낮고(50% 미만), |
|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면서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미만이고 | |||
|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미수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
|
|
|||
| 노드13 | 58 | 37.9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은 낮고(50% 미만), |
|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면서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이상이지만 | |||
|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
|
|
|||
| 노드14 | 19 | 63.2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은 낮고(50% 미만), |
| 신체적 개입을 일부만 수행하면서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이상이면서 | |||
|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미수립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
|
|
|||
| 노드15 | 25 | 52.0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으며(50% 이상), |
|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가 많으나(3인 이상) | |||
|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이 많고(10개 중 6개 이상)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미만인 종사자 | |||
|
|
|||
| 노드16 | 24 | 62.5 | 기관 내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으며(50% 이상), |
|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가 많고(3인 이상) | |||
|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은 많지만(10개 중 6개 이상) | |||
| 기관 종사자 상해 경험이 1달에 1회 이상인 종사자 | |||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이용시설의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과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사자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살펴보고,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통해 종사자의 감정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요인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종사자들에게 높은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일반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의 도전행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자해행동(응답기관의 90.8%), 타해행동(84.3%), 안전위협행동(49.2%), 기물 파손행동(51.8%)과 같이 이용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자의 안전한 개입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중 자해, 공격성, 파괴적 행동으로 지원자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되며, 이러한 행동의 심각성과 빈도가 종사자의 두려움과 불안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Hastings, 1995, Klaver et al., 2021). 이와 같은 도전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할 경우 종사자들은 즉각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요구받게 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간이용시설은 인력 부족, 교육 기회 제한,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로 인해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종사자가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다층적 지원 체계 및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더라도,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가 적으면 부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노드 6). 도전행동의 발생빈도는 종사자의 부정적 감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잦은 노출은 종사자가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전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 수도 많은 기관에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까지 적으면(노드9) 부정적 감정이 높은 종사자 비율이 66.7%로 상당히 높았다. 주간이용시설에 도전행동을 보이는 이용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사자의 감정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부정적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도전행동 지원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분노와 무력감이 줄고 긍정적 감정과 대처능력이 증가되었다고 하였고, 교육을 통해 감정조절이 가능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Hastings & Brown, 2002, McDonald 2010).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기술이 확립된 종사자들이 도전행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사자의 감정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고 신체적 개입도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기관의 종사자 상해 경험이 잦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의 종사자(노드14)는 부정적 감정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개입 중 일부를 수행하더라도 잦은 개입으로 종사자가 도전행동으로 인한 상해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 상해를 입은 종사자 뿐 아니라 목격한 동료 종사자의 감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전행동을 예방하고, 발생 시 지원하는 방법을 수행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계획 수립의 요구는 종사자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도 한다.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없이 계획 수립만 요구할 경우 지원계획 실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이 현실에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면 종사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이용시설의 실태에 맞는 현실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낮더라도 신체적 개입 방법을 모두 수행하는 종사자(노드4)는 높은 부정적 감정을 가진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개입은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신체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전행동이 심각해지는 경우 종사자들이 신체적 개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체적 개입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의 도전행동 이용자 현황과 관련하여 도전행동 이용자 비율이 높고, 도전행동이 매일 있는 이용자가 많은 기관에서는 교육을 다수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상해경험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노드 16). 따라서 도전행동 지원 과정에서 종사자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대응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사자 개인 차원에서는 감정조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단순히 도전행동의 정의와 개입 방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 스트레스 관리, 감정 인식, 회복 탄력성 강화 등의 감정 중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감정은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를 조절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긴장 상황에서 감정소진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 도전행동 발생 이후 감정 상태를 돌아보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디브리핑(Debriefing) 과정 역시 개인 감정 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최근 반영적 실천에 기반한 디브리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디브리핑은 도전행동 지원으로 인한 감정을 되돌아 보고, 팀 기반으로 정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한다(김미옥 외, 2024). 따라서 신체적 개입 시 디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신체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이 신체적 개입이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장하고, 신체적 개입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전제로 한 적용 및 관리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고, 팀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종사자가 감정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는 도전행동 대응을 위한 정기적이고 실천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을 마련하여 도전행동 발생 시 일관되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체적 개입은 종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되어야 하며, 팀 단위 대응이나 환경 조정 등 비신체적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전행동 발생 이후에는 종사자 감정을 점검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정례화되어야 하며, 감정 표현이 허용되는 조직문화 조성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도전행동 지원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도전행동이 잦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감정 노동자로서 인식하고,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정노동과 부정적 감정이 단순히 개별 종사자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전행동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지속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감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도전행동 이용자 관련 특성이나 지원 상황에 대해 알려진 정보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관에서 발생하는 도전행동 유형과 이에 따른 대응 방식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주간이용시설의 규모나 종사자 수,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실제적인 도전행동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도전행동 대응 지침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명확한 개입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사자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종사자들의 감정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관련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있다. 특히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나무모양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도전행동과 관련된 일부 예측요인에 제한하여 확인하였으며 연속변수를 중간값, 평균값 등의 기준으로 이진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로 인한 정보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감정을 쉽게 해석하기에 용이하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탐색적 차원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도전행동과 관련된 기관 이용자 현황, 지원하는 종사자의 신체적 개입과 상해경험, 도전행동 교육의 시행과 개인별 행동지원계획의 수립과 같이 예측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은 향후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다만 감정은 다각적인 주관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조직 지원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다각적인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전행동 지원에 대한 감정 연구에서 부정적 측면 외에 긍정적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도전행동 지원에 대한 긍정적 감정도 함께 확인하여 감정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간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외국 중심의 이론과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감정 표현 방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 연구를 기초로,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노동에 버거워하는 종사자의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제한된 변수 등의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감정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감정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주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종사자의 감정이 도전행동 지원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여, 개인과 조직 차원의 감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전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들이 확장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보건복지부. (2024. 3. 25.).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0764&tag=&nPage=1
보건복지부. (2025. 03. 31.).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5155&tag=&nPage=1
, , , & (2006). The response to challenging behaviour by care staff: Emotional responses, attributions of cause and observations of practic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 199-211. [PubMed]
, , & (2015). Burnout-depression overlap: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6, 28-41. [PubMed]
, , , , & (2017). Challenging behaviours in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 total population study and exploration of risk indices.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1), 16-32. [PubMed]
, & (1995). Beliefs and emotional reactions of care staff working with people with challenging behaviour.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39(4), 341-352. [PubMed]
eNCORD. (2023. 7. 18.). Evaluation Metrics in Machine Learning. https://encord.com/blog/f1-score-in-machine-learning/
, , , , & (2018). Is the amount of exposure to challenging behaviour related to staff work-related well-being in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Evidence from a clustered research desig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81, 155-161. [PubMed]
, & (2002). Behavioural knowledge, causal beliefs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special educators’ emotional reactions to challenging behaviou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46, 144-150. [PubMed]
(2002). Do challenging behaviors affect staff psychological wellbeing? Issues of causality and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7, 455-467. [PubMed]
, & (2003). Staff reactions to self-injurious behaviours in learning disability services: Attributions, emotional responses and helping. Br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189-203. [PubMed]
, , , & (2010). Staff reactions to challenging behaviour: An observation stud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 525-535. [PubMed]
, & (2024). Factors affecting the feelings of safety among individual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evere challenging behaviour in residential care: A qualitative study of professional and service users’ perspectiv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OnlineFirst, June 18, 2024. [PubMed] [PMC]
, & (2001). Coping, burnout, and emotion in staff working in community services for people with challenging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6, 448-459. [PubMed]
, & (1998). Learning disability care staff’s emotional reactions to aggressive challenging behaviour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441-449. [PubMed]
, , , , & (2021). Exposure to challenging behaviour and staf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and organisational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6, 104027. [PubMed]
, & (2005). Staff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impact of stress on attributions of challenging behaviour.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11), 827-838. [PubMed]
(2000). Carer’ attributions for challenging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57-68. [PubMed]
, , , & (2015). Towards a framework in interaction training for staff working with cli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ur.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60, 134-148. [PubMed]
, , & (2013).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s, and feelings of support staff working with cli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hallenging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4(11), 3916-392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8-0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8-20

- 394Download
- 1313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