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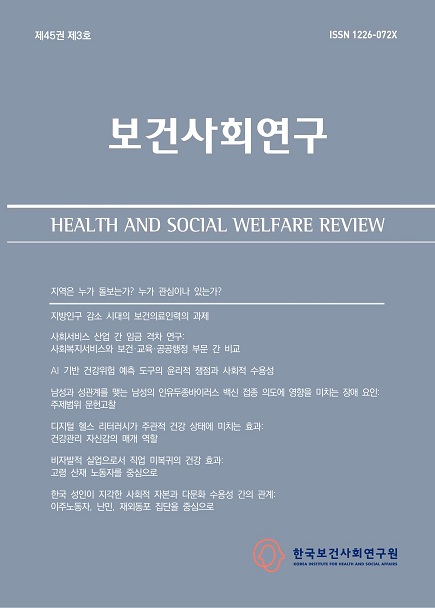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연구: 한국 의료 패널을 활용하여
A Study on the Health Literacy of Medical Aid Recipient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KHP)
Rhee, YungSeo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317-333,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31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건강정보 이해력은 아플 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나이, 낮은 교육 수준,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21년 자료를 이용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 수준과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질병 치료 방법을 찾거나, 다른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거나,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는 데서 큰 어려움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 불안감,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상용치료기관 여부가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려면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저학력, 만성질환,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 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 능력이 나아지고, 건강 형평성과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ackground: Health literacy is a key factor in achieving health equity, and its importan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Medical Aid recipien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1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n Health Panel (KHP) to examine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Results: Health literacy among Medical Aid recipi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mbers, especially in areas requiring complex understanding such as disease-related information search, determining the need for further treatment, and managing mental heal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education level, anxiety, subjectiv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and access to a regular healthcare provider as significant factors.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vulnerability of Medical Aid recipients in health literacy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
초록
배경: 건강 정보 이해력은 건강 형평성 실현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방법: 제2기 한국 의료 패널 2021년 부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질병 관련 정보 탐색,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 정신건강 관리 등 복합적 정보 이해가 요구되는 항목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상용 치료기관 여부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건강 정보 접근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Ⅰ. 서론
최근 건강 정보 이해력(Health Literacy)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건강 정보 이해력은 단순한 건강 정보의 수용 능력을 넘어, 개인이 건강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Nutbeam, 2000). 이는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선택 등 실천적 건강 행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Sørensen et al., 2012; WHO, 2013).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제5차 국민 건강 증진 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과제로 건강 정보 이해력(헬스리터러시)의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단순히 정보제공을 넘어, 개인의 건강 결정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낮은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적절한 의료 이용이나 건강행동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석준 외, 2024).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면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의 이환율이 높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나쁜 수준(정성식, 김창엽, 202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건강 상태의 차이를 넘어, 건강 관련 삶의 질(이현옥, 김교성, 2015), 건강수명 격차(동아사이언스, 2020)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 격차는 단순한 소득·교육 수준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 접근과 해석 능력의 격차, 즉 건강 정보 이해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수급자는 복잡한 의료정보를 이해하거나, 병원 이용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높은 장벽을 경험한다. 특히, 수급자의 상당수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고(신현웅 외, 2015; 김소애 외, 2019), 필수적 건강서비스 접근에서조차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부족하다. 다수의 연구는 의료급여제도의 운영 효율성이나 의료 이용량에 초점을 맞췄으며(노상윤, 윤석완, 2008; 정성식, 김창엽, 2021), 노인, 암환자, 중년여성,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특정 대상의 건강 정보 이해력을 분석하면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있지만(강수진 외, 2012; 김은진, 김수현, 2021; 김영선, 강은나, 2017; 오윤진, 박기현, 2021) 대표성 있는 국가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건강 정보 이해력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 정책 개입의 설계나 타당성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21년 한국 의료 패널 부가 조사에 포함된 건강 정보 이해력(HLS-EU-Q16) 문항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신체 건강 상태, 의료기관 이용 경험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건강 정보 이해력 기반 정책 설계의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을 위한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 정보 이해력(Health Literacy)의 개념과 의의
건강 정보 이해력은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Nutbeam, 2000). 특히 건강 정보 이해력은 단순한 기능적 읽기 능력 이상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건강행동을 매개하여 건강 결과를 형성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Von Wagner et al., 200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 정보 이해력을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를 21세기 공중보건의 전략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WHO, 2013). 건강 정보 이해력이 낮을 경우, 예방 접종률이 낮고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며, 약물 복용 오류나 만성질환 자기관리 실패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erkman et al., 2011; Lee et al., 2012).
Sørensen et al.(2012)은 건강 정보 이해력을 기능적, 상호작용적, 비판적 문해력으로 구분하며, 건강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의 세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 모델(HLS-EU-Q)을 제시하였다. 이 중 1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HLS-EU-Q16은 한국에서도 천희란, 이주열(2020)에 의해 한국어판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계량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2. 건강 정보 이해력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구조적 취약성
건강 정보 이해력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 고령화, 만성질환 및 장애 동반 등 복합적인 건강 취약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 이해, 활용 능력에서도 구조적인 제약을 경험한다(Sørensen et al., 2012). 미국의 Medicaid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Center for Health Care Strategies(2022)의 보고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이 낮은 경우 만성질환 관리, 특히 고혈압 환자의 약물 복약순응도가 저조하여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 정보 이해력 격차는 Medicaid 수급자의 건강 형평성 악화에 주요한 기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Sentell et al.(2017)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건강 정보 이해력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문화와 같은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으며, 건강 정보 이해력이 나이나 교육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임을 밝혔다. 이들은 선행 연구의 건강 정보 이해력 개념틀을 검토하면서, 건강 정보 이해력이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건강 정보의 이해와 활용, 건강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조직 환경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을 세 가지 사회적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지지가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의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며, 둘째, 공동체 수준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이 사회참여와 권한 강화 개념과 통합되어 작용한다고 보았다. 셋째, 조직 및 제도 수준에서는 정보 전달 방식, 의료 접근성, 조직의 문해력 친화성 등이 건강 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구조적 취약계층의 건강 정보 이해력을 단순한 개인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 결핍, 제도적 배제, 낙인 경험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정보 이해력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김은진과 김수현(2021)은 암 치료를 받는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이해력과 암 예방 행위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건강 정보 이해력이 암 예방 행위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 정보 이해력은 암 예방 지식, 신념 및 태도,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취약성이 건강행동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 정보 이해력의 부족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관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 형평성 악화와 건강수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현(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당수가 미 충족 의료 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건강 정보 이해력이 낮은 수급자는 진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의료비 지출 부담, 낙인 회피 등의 이유로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는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윤난희(2018)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자 경험(진료 시간의 충분성, 의사의 설명 이해 용이성, 질문 기회 제공 등)이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 이는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더 소극적이었으며, 그 결과 주관적 건강 수준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건강 정보 이해력이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기제임을 시사하며,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건강 정보 이해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소개되었고, 다양한 건강 정보 이해력 도구들이 활용되었으며,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확산되었다. 점차 타당한 측정 도구 개발과 건강 정보 이해력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나이, 성별, 사회적 자원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이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진 외(2012)는 서울 지역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이해 능력 실태를 조사하여 나이, 학력, 건강 상태와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김영선과 강은나(2017)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집단 간 건강 정보 이해력 차이를 분석하여,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의 유무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천희란과 이주열(2020)은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HLS-EU-Q16 한국어판을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건강 정보 이해력의 사회적 격차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 증가, 낮은 교육 수준, 경제적 취약성이 건강 정보 이해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한 의료 패널을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자,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이 뚜렷이 낮았다(문석준 외, 2024).
건강 정보 이해력과 건강 행위 수행 및 의료 이용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준호 외(2019)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건강 정보 이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이용 시 적극적으로 건강 정보를 활용함을 확인하였다. 건강 정보 이해 능력과 건강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김진현(2018)의 연구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은 건강 지식, 건강행동, 자기효능감, 복약순응도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변수들과 중간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건강 수준 및 건강 형평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건강 정보 이해력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참여율,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행동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질환을 가진 대상자별로 정은영과 황선경(2015)은 관상동맥질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이해 능력과 건강 행위 수행 수준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건강 정보 이해력이 건강관리 실천에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오지혜와 박은옥(2017)은 고혈압을 가진 노인 환자 집단에서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관리 행위 이행도가 높고,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지연과 전경자(2011)의 연구에서도, 기능적 건강 정보 이해력이 낮은 노인은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 행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건강 정보 이해력이 단순한 건강 정보 습득 능력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 건강행동 수행,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 이용 행태, 건강 형평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 격차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 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2기 한국 의료 패널(Korean Health Panel, 이하 KHP)의 2021년 부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적 실증연구이다. 종속변수인 건강 정보 이해력을 중심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신체 건강 상태,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집한 제2기 한국 의료 패널 2021년 연간 자료 및 건강 정보 이해력 부가 조사이다. 한국 의료 패널조사는 전국 단위의 국가승인 통계(제920012호)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이용 실태, 의료비 지출 수준,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제2기 패널의 표본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 센서스를 표본틀로 활용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동부/읍면부를 층화 변수로 하여 확률 비례 2단계 층화 집락 추출법에 따라 총 708개 조사구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항목 외에도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부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2021년 연간 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 이용 조사가 완료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참여 및 자료 활용에 전적으로 동의한 표본은 총 5,907가구, 13,799명의 가구원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성인 조사 대상자 중에서 건강 정보 이해력 부가 조사에 응답한 가구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 정보 이해력 부가 조사는 크게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과 건강 정보 탐색 경험 및 탐색 경로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 중 건강 정보 이해력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n=390)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n=9,324)는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일부 분석 단계에서만 활용되었다.
3. 변수 정의
가. 종속변수: 건강 정보 이해력
건강 정보 이해력은 HLS-EU-Q16(Korean version) 도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Pelikan & Ganahl(2017)의 HLS-EUS-Q16을 천희란, 이주열(2020)이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를 한국 의료 패널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16개의 설문항목을 도출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 산출을 위해 원자료를 이진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매우 쉽다’ 또는 ‘쉬운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그 외에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은 0점에서 16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점수는 연속형 변수로 처리되어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문항별 응답 패턴 분석도 병행하여 건강 정보 이해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포함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은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사회경제적 요인은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건강 관련 요인은 만성질환, 우울감, 불안감, 통증 불편, 주관적 건강 상태, 상용 치료 기관 유무이다. 나이는 조사된 대상자의 출생 년도를 자료조사 시점의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39세 이하’ ‘70세이상’은 하나의 구분으로,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단변량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원 조사에서 조사한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증 후 그룹간 차이에 따라 재분류하여 다변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교육 수준은 ‘고졸 이상’, 건강 상태 중 불안 유무는 ‘불안 없음’을,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과 ‘매우 좋음’을 통합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으로, 만성질환 유무는 ‘만성질환 없음’, 상용 치료 기관은 ‘상용병원 있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단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390명)와 건강보험 가입자(9,324명) 간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빈도, 비율) 및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문항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 상태, 상용의료기관 유무 등에 따라 각각 단변량 분석하였다. 각 변수 수준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으며, 필요시 사후검정(Scheffé)을 병행하였다.
넷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여 건강 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최선의 모형 도출을 위하여 Forward, Backword, Stepwise, Enter 방식으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최종 Enter 방식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0~16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총점이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결정계수(R²)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 .05에서 검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보험 가입자 집단과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비교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인구사회·경제적 측면과 건강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에서는 70세 이상 비율이 45.1%로 건강보험 가입자(28.1%)보다 높았고, 장애 보유 비율 또한 30.0%로 건강보험 가입자(6.4%) 대비 현저히 높았다(χ²=305.414, p<.001). 교육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42.6%로 두 배 이상 많았고, 대학교 이상 학력은 10.8%로 낮았으며(χ²=165.370, p<.001),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82.3%로 건강보험 가입자(32.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χ²=424.262, p<.001). 건강 상태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84.9%로 건강보험 가입자(55.6%)보다 높았고, 우울감과 불안감 경험 비율 또한 각각 15.1%, 10.3%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두 배 이상이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건강보험 가입자(70.2%)보다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쁨’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절반 이상 (51.5%)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8.2%)보다 현저히 높았다(χ²=302.110, p<.001).
표 1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건강보험 유형 | pearson chi square | |||||
|---|---|---|---|---|---|---|---|
| 건강보험 가입자 (n=9,324) | 의료급여 수급자 (n=390)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 인구학적 요인 | 성별 | 남 | 4,164 | 44.7% | 165 | 42.3% | - |
| 여 | 5,160 | 55.3% | 225 | 57.7% | |||
|
|
|||||||
| 나이 | 39 이하 | 1,546 | 16.6% | 24 | 6.2% | 86.693* | |
| 40 이상 49 이하 | 1,381 | 14.8% | 25 | 6.4% | |||
| 50 이상 59 이하 | 1,540 | 16.5% | 53 | 13.6% | |||
| 60 이상 69 | 2,240 | 24.0% | 112 | 28.7% | |||
| 70 이상 | 2,617 | 28.1% | 176 | 45.1% | |||
|
|
|||||||
| 장애 유무 | 예 | 598 | 6.4% | 117 | 30.0% | 305.414* | |
| 아니오 | 8,726 | 93.6% | 273 | 70.0% | |||
|
|
|||||||
| 사회경제학적 요인 | 결혼 상태 |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 6,661 | 71.4% | 114 | 29.2% | 427.057* |
|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 | 61 | 0.7% | 2 | 0.5% | |||
| 배우자 사망 | 1,019 | 10.9% | 112 | 28.7% | |||
|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음 | 461 | 4.9% | 90 | 23.1% | |||
| 결혼한 적 없음 | 1,122 | 12.0% | 72 | 18.5% | |||
|
|
|||||||
| 교육 수준 | 받지 않음(미취학 포함) | 306 | 3.3% | 35 | 9.0% | 165.370* | |
| 초등학교 | 1,639 | 17.6% | 131 | 33.6% | |||
| 중학교 | 1,273 | 13.7% | 77 | 19.7% | |||
| 고등학교 | 2,800 | 30.0% | 105 | 26.9% | |||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2,987 | 32.0% | 35 | 9.0% | |||
| 대학원 | 319 | 3.4% | 7 | 1.8% | |||
|
|
|||||||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임금근로자 | 3,891 | 41.7% | 44 | 11.3% | 424.262* | |
| 자활, 공공, 희망, 노인 일자리 | 475 | 5.1% | 12 | 3.1% | |||
| 고용주 | 156 | 1.7% | 0 | 0.0% | |||
| 자영업자 | 1,323 | 14.2% | 11 | 2.8% | |||
| 무급가족종사자 | 489 | 5.2% | 2 | 0.5% | |||
| 비경제활동인구 | 2,990 | 32.1% | 321 | 82.3% | |||
|
|
|||||||
| 건강 상태 | 만성질환 | 있음 | 5,184 | 55.6% | 331 | 84.9% | 130.713* |
| 없음 | 4,140 | 44.4% | 59 | 15.1% | |||
|
|
|||||||
| 우울감 | 있음 | 546 | 5.9% | 59 | 15.1% | 55.108* | |
| 없음 | 8,778 | 94.1% | 331 | 84.9% | |||
|
|
|||||||
| 불안감 | 있음 | 371 | 4.0% | 40 | 10.3% | 36.405* | |
| 없음 | 8,953 | 96.0% | 350 | 89.7% | |||
|
|
|||||||
| 통증/불편 |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음 | 6,546 | 70.2% | 164 | 42.1% | 142.382* | |
|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 있음 | 2,719 | 29.2% | 218 | 55.9% | |||
|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 | 59 | 0.6% | 8 | 2.1% | |||
|
|
|||||||
| 주관적 건강 상태 | 매우 좋음 | 301 | 3.2% | 2 | 0.5% | 302.110* | |
| 좋음 | 3,156 | 33.8% | 55 | 14.1% | |||
| 보통 | 4,175 | 44.8% | 132 | 33.8% | |||
| 나쁨 | 1,584 | 17.0% | 176 | 45.1% | |||
| 매우 나쁨 | 108 | 1.2% | 25 | 6.4% | |||
|
|
|||||||
| 상용치료기관 | 있음 | 5,583 | 59.9% | 314 | 80.5% | 66.823* | |
| 없음 | 3,741 | 40.1% | 76 | 19.5% | |||
2.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문항별 응답 비교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어렵다'는 응답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집단에서 가장 어려움 비율이 높은 문항은 12번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68.6%)’, 1번 ‘걱정되는 질병의 치료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68.1%)’, 5번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추가로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67.4%)’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번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알아내는 것‘ (62.1%), 6번 ’내 질병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61.9%)‘ 등에서도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집단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어려움 응답률이 50% 미만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문항은 5번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추가로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49.5%)'이었다. 이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건강 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문제는 정보 탐색, 판단 및 실천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며, 정보의 전달 방식과 접근성 개선 등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HLS-EU-Q16)
| 항목 (어려움, 매우 어려움) | 건강보험 유형 | 전체 (n=9,714) | pearson chi square | ||||
|---|---|---|---|---|---|---|---|
| 건강보험 가입자 (n=9,324) | 의료급여 수급자 (n=390)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 1. 걱정되는 질병의 치료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 | 4,472 | 44.7% | 286 | 68.1% | 4,758 | 45.7% | 88.621* |
|
|
|||||||
| 2. 아플 때 전문적인 도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 3,871 | 38.7% | 240 | 57.1% | 4,111 | 39.5% | 57.227* |
|
|
|||||||
| 3. 의사가 내게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 | 1,574 | 15.7% | 102 | 24.3% | 1,676 | 16.1% | 21.769* |
|
|
|||||||
| 4. 처방된 약의 복용 방법에 대한 의사나 약사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 | 935 | 9.4% | 72 | 17.1% | 1,007 | 9.7% | 28.001* |
|
|
|||||||
| 5.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추가로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c | 4,953 | 49.5% | 283 | 67.4% | 5,236 | 50.3% | 51.263* |
|
|
|||||||
| 6.내 질병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 | 3,962 | 39.6% | 260 | 61.9% | 4,222 | 40.5% | 82.925* |
|
|
|||||||
| 7. 의사나 약사나 말한 지시를 따르는 것 | 1,022 | 10.2% | 73 | 17.4% | 1,095 | 10.5% | 21.945* |
|
|
|||||||
| 8.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 | 4,563 | 45.6% | 280 | 66.7% | 4,843 | 46.5% | 71.577* |
|
|
|||||||
| 9. 흡연, 운동부족, 과음과 같은 행동에 대한 건강 위험 경고를 이해하는 것 | 2,293 | 22.9% | 167 | 39.8% | 2,460 | 23.6% | 63.232* |
|
|
|||||||
| 10. 나에게 왜 건강검진이 필요한 지를 이해하는 것 | 1,136 | 11.4% | 93 | 22.1% | 1,229 | 11.8% | 44.994* |
|
|
|||||||
| 11. 미디어에서 얻은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믿을만한지 판단하는 것 | 4,564 | 45.7% | 269 | 64.0% | 4,833 | 46.4% | 54.806* |
|
|
|||||||
| 12.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 4,657 | 46.6% | 288 | 68.6% | 4,945 | 47.5% | 78.110* |
|
|
|||||||
| 13.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알아내는 것 | 3,724 | 37.3% | 261 | 62.1% | 3,985 | 38.3% | 105.693* |
|
|
|||||||
| 14. 건강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이해하는 것 | 1,234 | 12.3% | 92 | 21.9% | 1,326 | 12.7% | 33.157* |
|
|
|||||||
| 15.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는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 | 2,963 | 29.6% | 220 | 52.4% | 3,183 | 30.6% | 98.213* |
|
|
|||||||
| 16. 나의 일상적 행동이 내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 | 3,393 | 33.9% | 228 | 54.3% | 3,621 | 34.8% | 73.545* |
3.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정보 이해력 평균 차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평균 점수는 8.35점(SD=4.89)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1.07점(SD=4.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취약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성(8.94점)이 여성(7.91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4.583, p<.05). 나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39세 이하의 나이대가 가장 높은 점수(13.27점)를 보였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F=12.708, p<.001). 교육 수준 역시 건강 정보 이해력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고졸 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 (10.47점 이상)이 중졸 이하(5.05점~7.49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21.232, p<.001).
또한, 건강 상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33.618, p<.001),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집단도 있는 집단보다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12.004, p<.01, F=10.825, p<.01). 주관적 건강 상태가 긍정적일수록 건강 정보 이해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8.713, p<.001),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통증 여부 역시 건강 정보 이해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이 인구 사회학적,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적 특성별 건강 정보 이해력 평균 차이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F, p | ||
|---|---|---|---|---|---|
| 인구학적 요인 | 성별 | 남a | 8.94 | 4.79 | 4.583* |
| 여b | 7.91 | 4.93 | a>b | ||
|
|
|||||
| 나이 | 39 이하a | 13.27 | 4.62 | 12.708*** | |
| 40 이상 49 이하a | 9.61 | 6.38 | a>b | ||
| 50 이상 59 이하a | 10.38 | 5.48 | |||
| 60 이상 69 이하b | 8.60 | 5.08 | |||
| 70 이상b | 7.22 | 4.07 | |||
|
|
|||||
| 장애유무 | 예 | 7.83 | 4.78 | - | |
| 아니오 | 8.58 | 4.93 | |||
|
|
|||||
| 사회경제학적 요인 | 결혼상태 |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a | 8.81 | 4.56 | 4.913** |
|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b | 4.00 | 2.83 | |||
| 배우자 사망b | 6.79 | 3.89 | a>b | ||
|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음b | 9.00 | 5.28 | |||
| 결혼한 적 없음a | 9.22 | 5.66 | |||
|
|
|||||
| 교육수준 | 받지 않음(미취학 포함)a | 5.05 | 3.77 | 21.232*** | |
| 초등학교a | 6.92 | 4.21 | a<b | ||
| 중학교a | 7.49 | 4.59 | |||
| 고등학교b | 10.47 | 4.80 | |||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b | 12.40 | 4.11 | |||
| 대학원b | 13.57 | 2.82 | |||
|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임금근로자a | 10.81 | 5.05 | ||
| 자활, 공공, 희망, 노인 일자리a | 10.75 | 4.92 | 4.744** | ||
| a>b | |||||
| 고용주 | - | - | |||
| 자영업자a | 8.75 | 5.15 | |||
| 무급가족종사자a | 10.00 | 1.41 | |||
| 비경제활동인구b | 7.90 | 4.76 | |||
|
|
|||||
| 건강 상태 | 만성질환 | 있음a | 7.78 | 4.58 | 33.618*** |
| 없음b | 11.46 | 5.35 | a<b | ||
|
|
|||||
| 우울감 | 있음a | 6.51 | 4.42 | 12.004** | |
| 없음b | 8.71 | 4.90 | a<b | ||
|
|
|||||
| 불안감 | 있음a | 6.19 | 4.54 | 10.825** | |
| 없음b | 8.63 | 4.87 | a<b | ||
|
|
|||||
| 통증/불편 |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음a | 9.22 | 5.04 | 5.637* | |
|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 있음b | 7.80 | 4.73 | a>b | ||
|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b | 5.78 | 2.95 | |||
|
|
|||||
| 주관적 건강 상태 | 매우 좋음a | 16.00 | 0.00 | 8.713*** | |
| 좋음a | 9.17 | 4.55 | a>b | ||
| 보통a | 9.79 | 4.85 | |||
| 나쁨b | 7.04 | 4.62 | |||
| 매우 나쁨b | 8.46 | 5.24 | |||
|
|
|||||
| 상용치료기관 | 있음a | 8.31 | 4.64 | - | |
| 없음b | 8.48 | 5.77 | |||
4.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과 관련 요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상용치료기관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220, p<.001, R²=.254),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VIF 1.033~1.408).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은 건강 정보 이해력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β=.370, p<.001).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건강 정보 이해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β=.167, p<.01),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는 대상자(β=.156, p<.001)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대상자(β=.125, p<.01) 역시 건강 정보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 치료기관을 보유한 경우도 건강 정보 이해력이 더 높았다(β=.124, p<.001).
표 4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 변수 | 범주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t | 공선성 통계량 | |||
|---|---|---|---|---|---|---|---|---|
| B | 표준화 오류 | 베타 | 공차 | VIF | R 제곱 변화량 | |||
| (상수) | 2.773 | 0.795 | 3.490** | |||||
|
|
||||||||
| 교육 수준 | 고졸미만 (기준) | |||||||
| 고졸이상 | 3.764 | 0.457 | 0.370 | 8.243*** | 0.895 | 1.118 | 0.173 | |
|
|
||||||||
| 불안감 | 없음(기준) | |||||||
| 있음 | 2.398 | 0.662 | 0.156 | 3.622*** | 0.968 | 1.033 | 0.036 | |
|
|
||||||||
| 주관적 건강 상태 | 보통이하(기준) | |||||||
| 좋음, 매우좋음 | 1.228 | 0.449 | 0.125 | 2.734** | 0.856 | 1.168 | 0.021 | |
|
|
||||||||
| 만성 질환 | 있음(기준) | |||||||
| 없음 | 2.259 | 0.680 | 0.167 | 3.321** | 0.710 | 1.408 | 0.011 | |
|
|
||||||||
| 상용 병원 | 없음(기준) | |||||||
| 상용병원있음 | 1.489 | 0.566 | 0.124 | 2.630*** | 0.809 | 1.236 | 0.012 | |
|
|
||||||||
| F: 28.220, P<0.001, R-square: 0.254 | ||||||||
Ⅴ. 논의
본 연구는 제2기 한국 의료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과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미디어 정보 해석,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 정신건강 관리 등 복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서 어려움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상용치료기관 여부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으며, 특히 미디어 정보 해석,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 정신건강 관리 정보 활용 등 복합적이고 비판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났다. 이는 정보 이해의 어려움이 개인적 능력 부족을 넘어, 건강 정보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고차원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상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건강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건강 정보를 찾고 평가하여 건강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은 디지털 건강 정보 이해력(eHealth literacy) 으로 정의된다(Norman & Skinner, 2006).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디지털 건강 정보 이해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최은진, 2022), 이와 사회 경제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 진료 필요성 판단의 어려움에 관한 결과는 이영선 외(2012)의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방암 환자가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의료진의 말을 이해하고 추가 진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 건강 정보 이해력은 질병이 의심되어 추가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건강행동을 지연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건강 정보 제공 정책은 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해석 및 비판적 활용 능력 강화를 포함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면 상담, 건강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상담지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작 등 보완적 전략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인영 외(2015)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건강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한 바 있다.
둘째, 건강 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불안감 유무,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상용치료기관 보유 여부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과 정신건강 상태는 건강 정보 이해력의 중심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기능하며, 특히 정신건강이 취약한 수급자 집단은 복합적 정보해석 상황에서 더욱 큰 취약성을 보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에서도 교육 수준은 기본적인 인지 역량과 건강 정보 활용 능력 모두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신건강 상태 역시 건강 정보의 수용과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erkman et al., 2011; Lee et al., 2012).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학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나, 저학력자들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수급자는 건강 정보를 탐색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의 영향력을 분석한 Levy & Meltzer(2008)의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자체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상태와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 전략 수립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건강 정보 이해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상태 변수인 불안감이나 만성질환 여부 변수 역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나 건강 정보 제공 시 교육 수준 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 정보 제공뿐 아니라 건강 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상담 서비스 등이 병행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상용치료기관 보유 여부가 건강 정보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상용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익숙한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건강 정보와 의료상담을 받을 경우, 정보의 이해도와 활용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윤난희(2018)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참여가 건강 수준 향상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수급자가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이고 구조적인 개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사례 관리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관과의 정기적 상담 및 건강 정보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건강 정보 이해력 수준이 특히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 건강 정보 습득 및 활용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치료순응도 및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단면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건강 정보 이해력과 관련 요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들 요인이 건강 정보 이해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건강 정보 전달 매체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의 외부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 수준, 정신건강, 만성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상용치료기관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R²=0.254).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횡단자료의 특성상 시간적 인과성을 확인하지 못한 점과 함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지지, 의료체계 접근성, 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성 및 질적 특성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건강 정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건강 정보 매체 및 사회적 자원을 포함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정보 이해력 영향 요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디지털 건강 정보 이해력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만을 독립된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이 집단의 건강 정보 이해력 특성과 관련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고, 단일 점수 수준을 넘어 16개 문항별 건강 정보 이해력 응답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보 탐색, 해석, 적용 등 세부 기능별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관리, 미디어 건강 정보 해석, 추가 진료 판단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 활용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수급자의 심각한 취약성을 밝혀냄으로써, 건강 정보 이해력 기반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수급자 집단의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동아사이언스. (2020, January 7). 고소득자-저소득자 건강수명 11년 격차…"건강불평등 심각".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3573
보건복지부.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8&list_no=365340&mid=a10401000000
Center for Health Care Strategies. (2022). Using health literacy strategies to advance equity in Medicaid. https://www.chcs.org/using-health-literacy-strategies-to-advance-equity-in-medicaid/
, , , & (2012). Health literacy and women’s health-related behaviors in Taiwan. Health Education & Behavior, 39(2), 210-218. [PubMed]
, & (2008). The impact of health insurance on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9(1), 399-409. [PubMed]
, , , & (2009). Health literacy and health actions: A review and a framework from health psychology. Health Education & Behavior, 36(5), 860-877. [PubMe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Health Literacy: The Solid Fact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128703/e96854.pdf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3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8-20

- 303Download
- 1506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