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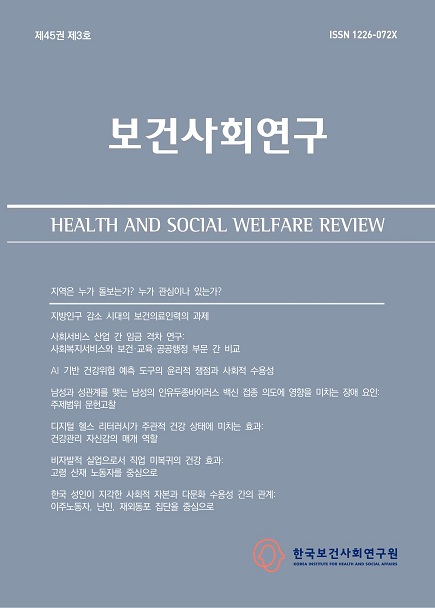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사회인지적 요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ognitive Factors on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Yu, Seunghee1
보건사회연구, Vol.45, No.3, pp.293-316, Sept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3.316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장애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은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인지적 태도가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일정하게 증가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여성장애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낮았다. 장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수용할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디게 증가하였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억제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감소했으나, 장애로 인해 더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가족의 정서적 지지, 거주지역의 편리함,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높았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될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감소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용, 태도, 감정 표출,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인지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cognitive factors on these changes,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analysis was based on data from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focusing on 3,962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The rate of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men than women.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had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Higher level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acceptanc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life satisfaction, but the rate of increase was attenuated.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was linked to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whereas effort due to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levels. Household income,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convenience of residential area, and emotional support from others all contributed to higher initial life satisfaction. However, emotional support from others was also found to moderate the rate of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Greater social isol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initia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improvements in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초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의 성인장애인 3,9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일정하게 증가했다.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여성장애인보다 높았다.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낮았다. 장애에 대한 인지와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나,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완화되었다. 감정표출 억제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감소했으나, 장애로 인한 노력은 삶의 만족도 초기치를 증가시켰다. 가구소득, 가족의 정서적 지지, 거주지역 편리,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초기치를 높였으나,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증가율을 완화시켰다. 사회적 분리가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감소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한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4년 249.4만 명, 2017년 254.6만 명, 2020년 262.3만 명에서 2023년 5월 말 기준 264.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하였으며, 향후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애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사회·경제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김자영, 한창근, 2016; 전리상, 2017).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김수용, 2010; 석관호, 윤세정, 2021; 전동일, 양숙미, 201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정도로서, 자신이 살아온 생활 전반에 관하여 갖는 기대, 목표,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민경진, 황진수, 2007; 송정숙, 2022). 이처럼 삶의 만족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기대 수준을 현재 생활에서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현재 생활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열악할 위험이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만족도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Cummins et al., 2002).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접근은 질병, 치료,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 지원 및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 혹은 안녕감 보장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김용득, 2017; 윤희정, 신자은, 2015).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성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오혜경, 정덕진, 2010).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미래 행동과 정서는 개인적 특성, 행동,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Bandura, 1986). 개인적 특성은 한 사람의 인지, 정서, 생물학적 특성으로서, 기대와 신념, 자기인지, 사고, 느낌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인종, 신체조건 등이 해당된다. 행동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 행동수행력, 자기 조절 등을 의미한다. 환경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요소로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비롯하여 공간, 시설, 경제여건과 같은 물리적·물질적 환경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 관련 특성과 같은 인구학적·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같은 행동적 요인도 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타인의 지지, 주거환경, 경제형편 등의 환경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특성, 행동, 환경 관련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김성희, 2016; 김영수, 윤수인, 2019; 이지수, 2011; 전리상,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소득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행동하고 있는지, 즉,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정보 접근의 제약, 교육이나 사회 참여 기회의 제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을 부적절하게 느끼고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권복순, 박현숙, 2005). 이러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장애인을 심리·사회적으로 위축시키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황지연, 2017). 반면에, 자신이 처한 현실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은 심리사회적으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외부의 부정적 자극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내면화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백은령, 2004). 따라서 장애라는 특수성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지수, 2011).
한편, 장애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체적·심리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자료만을 분석하는 횡단연구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한계를 가진다(김성희, 2016; 김영수, 윤수인, 2019; 이지수, 2011; 전리상, 2017).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시점에서 조사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구성함으로써,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지적 특성), 행동 요인, 환경 요인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제시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인지이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한 행동주의이론(behaviorism)은 외부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아, 인간을 둘러싼 환경, 특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chunk, 2012). 이후 195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지주의이론(cognitivism)에서는 기존의 행동주의이론에서 간과된 개인의 사고, 기억, 인지, 해석, 추론 등과 같은 정신적 활동이 새로운 행동의 획득과 학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Clark, 2018). 이처럼 행동주의이론은 외부의 자극과 행동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고, 인지주의이론은 내적 정보 처리 과정과 정신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1986년에 Bandura에 의해 개진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환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에서의 인지적 활동을 모두 중요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앞의 두 이론의 특성을 모두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즉, 사회인지이론은 사람의 인지 현상, 인지에 기초한 행동, 환경 변화 등 인간, 행동, 환경, 이 세 가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포괄적인 심리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적 특성, 행동,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지속적,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미래의 행동과 정서가 결정된다고 본다(Bandura, 1986). 사회인지이론은 외적 자극에 해당하는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또한 환경을 구성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이 이론에서는 인지적 기능을 포함한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이 행동 및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조율한다고 본다.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적 요인은 한 사람의 인지, 정서, 생물학적 특성을 의미하며, 행동 요인은 특정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한다. 환경 요인은 개인의 특정 행위의 활성화나 저하,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개인을 둘러싼 외적 자극이나 상황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인지이론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역학을 제시하며, 개인의 현재 행동과 인지가 미래의 행동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율, 2009).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다(이정석 외, 2017).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의 경험, 모방, 학습을 통한 인지과정을 거쳐 환경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존재이며, 인간 고유의 특징인 사전 사고(Forethought), 자기 성찰(Self Reflection), 자기 통제(Self Control)를 통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Bandura, 200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게 동일한 객관적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따라 개개인이 삶에 대해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개인의 인지와 행동은 장애인의 자기결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은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인간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길 원하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적을 세우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박정임, 이금진, 2012; Wehmeyer & Bolding, 2001).
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들을 사회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개인적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크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내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김성희, 2016; 전동일, 양숙미, 2012),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기도 한다(김영수, 윤수인, 2019; 송미영, 2011). 성별에 대한 결과도 상이한 경향이 있는데,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연구(김성희, 2016; 김영수, 윤수인, 2019)와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권오균, 2008; 송미영, 2011)가 공존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김승호, 외, 2016; 신승배, 2017). 장애유형의 경우, 65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외부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과 감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윤희정, 신자은, 2015; 최윤정, 2018).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청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한상윤, 남석인, 2023). 장애정도의 경우, 경증일수록, 일상생활 도움에 대한 필요가 낮을수록(권오균, 2008; 송미영, 2011)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반면,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이 저하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Aprile et al., 2006).
장애인의 심리내적 특성으로 장애수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장애수용은 장애로 인한 변화와 한계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가치를 저하하지 않으며 장애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김가희 외, 2019). 장애수용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서, 심리사회적 적응을 통한 장애 극복을 반영하고 있다(간우선 외, 2012).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연 외, 2021; 최수빈, 2024; Ditchman et al., 2017). Belgrave와 Walker(1991)는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장애에 대한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자신과 장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백수진 외, 2018),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삶의 적응과 관련되고, 장애 그 자체보다도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행동 요인
사회인지이론에서 행동은 특정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개인의 의도나 의지, 또는 실제 행동적 반응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이정은 외, 2020; Bandura, 1986). 이러한 행동에는 사회활동, 자기표현, 문제대처 등이 포함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심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이강순, 2014). 실제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수, 윤수인, 2019; 송정숙, 2022).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정보 접근의 제약,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외부활동을 기피하며 자신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이정은 외, 2020; 황지연, 2017).
장애인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내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에 위축되거나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며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기 있다(주은선, 김희정, 2022).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은선과 김희정(2022)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서로 존중하며 능동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로 확장되어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의 참여로 이어졌으며, 장애인이 힘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함으로써 정신적 성숙과 안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대처는 증상 완화와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반면, 소극적 대처는 증상 악화와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형 외, 2005; 노춘희,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선택한 삶의 태도, 즉 행동 요인들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 환경 요인
WHO(2001)에서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체계)를 통하여 개인의 기능과 장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다섯 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보조기기, 보행기, 휠체어, 스마트기기, 환경조절기 등의 제품과 기술(products and technology), 건물 구조, 도로, 계단, 접근성, 기후, 지리적 조건 등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natural environment and human-made changes), 가족, 친구, 보호자, 동료, 전문가 등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지원과 관계(support and relationships), 주변인의 장애에 대한 편견, 수용, 차별, 존중 등을 의미하는 태도(attitudes), 교육, 복지, 고용, 교통, 보건의료 등의 제도 및 정책을 의미하는 서비스, 시스템, 정책(services, systems and policies)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소득이나 거주지역 환경과 같은 제도 및 정책, 자연환경과 인공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배제 및 차별과 같은 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되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균, 2008; 김성희, 2016; 전동일, 양숙미, 2012).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동 편리성이나 시설 환경과 같은 거주지역 환경이 좋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봉, 고재욱, 2011; 오혜경, 백은령, 2003).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이 질병이나 재해 이후 손상된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를 다시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고, 장애인의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혜경, 백은령, 2003; 이지수, 2007).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낙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을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태도는 장애인에게 전달되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며, 사회활동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정은 외, 2020; 주은선, 김희정, 2022). 장애 차별 경험이나 사회의 부정적 편견, 낙인을 경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이선영, 2004. 이지수, 2011). 김자영과 한창근(2016)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이나 집단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편견, 낙인 등을 경험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과 삶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자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낮아지게 하는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그러한 환경에 대해 개인이 취하는 태도, 즉 행동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행동 요인, 환경 요인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김영수, 윤수인, 2019; 김자영, 한창근, 2016; 송정숙, 2022),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성이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지를 비롯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와 같은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횡단분석에 그치고 있어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변화 양상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김성희, 2016; 백수진 외, 2018; 오혜경, 백은령, 200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조사한 장애인삶 패널조사 1차(2018년)에서 4차(2021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장애 수용 과정과 사회적 관계 변화, 개인·가족·사회적 특성 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를 등록한 등록장애인과 그 가구원이며, 표본 추출은 먼저 읍면동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을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기준으로 층화하여 계통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이 인지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응답을 주요 자료로 수집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본 연구는 2018년 기준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중 1차부터 4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장애인 3,9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0대 235명(5.9%), 30대 266명(6.7%), 40대 522명(13.2%), 50대 1,320명(33.3%), 60대 1,301명(32.8%), 70대 이상 318명(8%)으로 분포되어 있다.
2. 변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1(매우 불만족한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의 10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2018), 2차(2019), 3차(2020), 4차(2021) 자료의 삶의 만족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회인지이론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개인적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성하였다(김성희, 2016; 백수진 외, 2018; 송정숙, 2022; 오혜경, 백은령, 2003; Bandura, 1986).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서 1차(2018) 자료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인지적 특성으로 장애수용, 장애에 대한 인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코딩하였다. 학력은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5), 4년제 대학(=6), 석사(=7), 박사(=8)로 측정하였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안면장애로 구분하였으며,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장애정도는 경증은 0, 중증은 1로 코딩하였다.
장애수용은 Kaiser et al.(1987)에 의해 개발된 장애수용 척도와 백영승 외(2001)가 개발하고 강용주 외(2008) 가 타당화한 장애수용검사에 근거한 1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장애수용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든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장애수용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인지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서 “나는 장애의 발생원인, 치료, 관리 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 정도로서 “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행동 요인
행동 요인은 외부활동 회피, 감정표출 억제, 장애로 인한 노력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외부활동 회피는 “나는 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감정표출 억제는 “나는 장애로 인해 나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장애로 인한 노력은 “나는 장애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 애쓴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환경 요인
본 연구에서는 WHO(2001)의 ICF에서 제시된 환경 요인에 근거하여, 제도 및 정책 요인으로서 가구소득, 지원과 관계 요인으로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요인으로서 거주지역 편리, 태도 요인으로서 사회적 분리,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변수들로 환경 요인을 구성하였다. 가구소득은 월 가구소득으로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6), 600 만원 이상~700만원 미만(=7),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8),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9),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 1,000만원 이상(=11)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역 편리는 거주지역 생활 시 편리한 정도에 대하여 1(매우 불편하다)에서 4(매우 편하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는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분리는 “나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은 “나는 사회가 장애를 보는 관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의 측정오차를 통제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차의 유의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이다(배병렬, 2018).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Amos23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무조건적(unconditional)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이때 무변화모형(unchaged model)과 선형모형(linear model)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다음으로 사회인지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차(2018) 조사에서 측정된 개인적 요인(성별,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수용, 장애에 대한 인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행동 요인(외부활동 회피, 감정표출 억제, 삶에 대한 노력), 환경 요인(가구소득, 가족의 정서적 지지,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 거주지역 편리, 사회적 분리,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조건적(conditional)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χ2, CFI, TLI, NFI, RMSEA를 활용하였는데, CFI, TLI, NFI는 0.9 이상, RMSEA는 0.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하였다(우종필, 2012).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이 왜도 절댓값 3이하, 첨도 절댓값 1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 분포의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았다(Kline, 2011). 성별은 여성장애인이 45.8%, 남성장애인이 54.2%를 차지했다. 학력은 중졸 이하 39.6%, 고졸 42.6%로 80% 이상의 장애인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내부·안면장애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17.9%)와 청각·언어장애(17.5%)가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정도는 경증과 중증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했다. 장애수용은 보통 정도의 수용 수준을 평균적으로 나타냈으며, 장애에 대한 인지 수준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활동 회피, 감정표출 억제, 장애로 인한 노력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이며, 거주지역의 편리함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지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주변 사람의 지지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분리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1차 년도 4.77에서 4차년도 5.36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3,962)
| 변수 | 범주 | 빈도(명) | % | 왜도 | 첨도 |
|
|
|||||
| 성별 1차 | 여 | 1814 | 45.8 | -0.17 | -1.97 |
| 남 | 2148 | 54.2 | |||
| 학력 1차 | 초등학교 이하 | 831 | 21.0 | 0.21 | -0.06 |
| 중졸 | 737 | 18.6 | |||
| 고졸 | 1689 | 42.6 | |||
| 대학 | 655 | 16.5 | |||
| 대학원 이상 | 50 | 1.3 | |||
| 장애유형 1차 | 지체장애 | 708 | 17.9 | 0.04 | 0.08 |
| 뇌병변장애 | 622 | 15.7 | |||
| 시각장애 | 529 | 13.4 | |||
| 청각·언어장애 | 692 | 17.5 | |||
| 지적·자폐성장애 | 208 | 5.2 | |||
| 정신장애 | 244 | 6.2 | |||
| 내부·안면장애 | 959 | 24.2 | |||
| 장애정도 1차 | 경증 | 2015 | 50.9 | 0.03 | -2.00 |
| 중증 | 1947 | 49.1 | |||
|
|
|||||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
|||||
| 장애수용 1차 | 2.35 | 0.38 | -0.07 | 0.43 | |
| 장애에대한 인지 1차 | 2.92 | 0.64 | -0.41 | 0.68 | |
|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1차 | 2.75 | 0.64 | -0.46 | 0.45 | |
| 외부활동 회피 1차 | 2.62 | 0.82 | -0.16 | -0.47 | |
| 감정표출 억제 1차 | 2.59 | 0.69 | -0.28 | -0.09 | |
| 장애로 인한 노력 1차 | 2.58 | 0.66 | -0.39 | -0.03 | |
| 가구소득 1차 | 3.05 | 2.10 | 1.53 | 2.75 | |
| 거주지역 편리 1차 | 2.88 | 0.51 | -0.87 | 2.52 | |
| 가족의 정서적 지지 1차 | 3.00 | 0.85 | -0.81 | 0.28 | |
|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 1차 | 2.76 | 0.81 | -0.42 | -0.20 | |
| 사회적 분리 1차 | 2.45 | 0.77 | -0.04 | -0.40 | |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1차 | 2.65 | 0.66 | -0.17 | -0.09 | |
| 삶의 만족도 1차 | 4.77 | 2.05 | 0.21 | -0.53 | |
| 삶의 만족도 2차 | 5.09 | 1.93 | 0.04 | -0.47 | |
| 삶의 만족도 3차 | 5.15 | 1.89 | 0.01 | -0.42 | |
| 삶의 만족도 4차 | 5.36 | 1.90 | 0.07 | -0.37 | |
2. 무조건 모형
본 연구에서는 1년 단위로 4개 시점에서 측정된 장애인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NFI=0.97, TLI=0.978, CFI=0.971, RMSEA=0.074)가 무변화모형(NFI=0.882, TLI=0.937, CFI=0.884, RMSEA=0.126)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을 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조건모형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선형모형에서 삶의 만족도 초기치의 평균은 4.816(p<.001),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평균은 0.553(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4.816이며, 1년 지날 때마다 0.553씩 일정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모형적합도
| 모형 | χ 2 | df | NFI | TLI | CFI | RMSEA |
|---|---|---|---|---|---|---|
| 무변화 | 704.62*** | 11 | 0.882 | 0.937 | 0.884 | 0.126 |
| 선형 | 181.665*** | 8 | 0.97 | 0.978 | 0.971 | 0.074 |
3. 조건 모형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조건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 (47)=206.73(p<.001), NFI는 0.99, TLI는 0.95, CFI는 0.992, RMSEA 는 0.029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조건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추정계수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각 예측 변인들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개인적 요인 중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장애인에 비해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5, p<.05). 장애유형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내부· 안면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낮은 반면(β=-0.417, p<.001), 청각·언어장애인은 내부·안면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β=0.313, p<.001). 지적·자폐성장애인은 내부·안면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나(β=0.582, p<.0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이 내부·안면장애인에 비해 감소했다(β=-0.134, p<.01).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낮았다(β=-0.42, p<.001). 장애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증가하였으나(β=1.743, p<.0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25, p<.001).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나(β=0.135, p<.0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36, p<.05).
표 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 추정치
| 경로 |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
| 성별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67 | 0.047 | -0.022 |
| 성별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5* | 0.02 | 0.086 |
| 학력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68*** | 0.018 | 0.059 |
| 학력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07 | 0.008 | 0.033 |
| 지체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67 | 0.073 | 0.017 |
| 지체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46 | 0.031 | 0.062 |
| 뇌병변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417*** | 0.076 | -0.099 |
| 뇌병변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22 | 0.033 | -0.028 |
| 시각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84 | 0.079 | 0.019 |
| 시각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04 | 0.034 | 0.004 |
| 청각·언어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313*** | 0.073 | 0.078 |
| 청각·언어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19 | 0.032 | -0.026 |
| 지적·자폐성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582*** | 0.114 | 0.085 |
| 지적·자폐성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134** | 0.049 | -0.103 |
| 정신장애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5 | 0.107 | 0.008 |
| 정신장애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08 | 0.046 | -0.007 |
| 장애정도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42*** | 0.052 | -0.137 |
| 장애정도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06 | 0.022 | 0.01 |
| 장애수용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1.743*** | 0.076 | 0.433 |
| 장애수용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225*** | 0.033 | -0.296 |
| 장애에 대한 인지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135*** | 0.04 | 0.057 |
| 장애에 대한 인지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36* | 0.017 | -0.08 |
|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77 | 0.042 | 0.032 |
|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34 | 0.018 | -0.075 |
| 외부활동 회피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3 | 0.036 | -0.016 |
| 외부활동 회피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24 | 0.015 | -0.067 |
| 감정표출 억제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102** | 0.039 | -0.046 |
| 감정표출 억제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06 | 0.017 | 0.015 |
| 장애로 인한 노력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111** | 0.04 | 0.048 |
| 장애로 인한 노력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11 | 0.017 | -0.024 |
| 가구소득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117*** | 0.012 | 0.161 |
| 가구소득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1 | 0.005 | -0.069 |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234*** | 0.031 | 0.13 |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23 | 0.013 | -0.069 |
|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3*** | 0.033 | 0.159 |
|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49*** | 0.014 | -0.139 |
| 거주지역 편리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266*** | 0.047 | 0.088 |
| 거주지역 편리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25 | 0.02 | -0.044 |
| 사회적 분리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119*** | 0.035 | -0.06 |
| 사회적 분리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26 | 0.015 | 0.07 |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 삶의 만족도 초기치 | -0.059 | 0.039 | -0.025 |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 삶의 만족도 변화율 | 0.016 | 0.017 | 0.036 |
행동 요인 중 감정표출을 많이 억제할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감소하는 반면(β=-0.102, p<.01), 장애로 인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11, p<.01). 환경 요인 중 가구소득이 높을수록(β=0.117, p<.001), 거주지역 편리성이 높을수록(β=0.266, p<.001),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β=0.234, p<.001)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증가하였다. 주변 사람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증가하나(β=0.3, p<.0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이 감소하였다(β=-0.049, p<.001). 사회적 분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감소하였다(β=-0.119,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네 개의 시점에서 측정된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희, 2016; 전동일, 양숙미, 2012).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와 이로 인한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신체적·심리적 불편함이 감소되기 때문일 수 있다(송충숙, 2016). 또한 최근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 고용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체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어 왔는데, 그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에게 체감되기 때문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 성취보다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Erikson, 1998).
사회인지적 요인들 중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의 경우, 초기에는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장애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을 일부 지지한다(권오균, 2008; 송미영, 2011).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적 상황에 직면하여 교육, 취업, 결혼, 부모의 지원 등에 있어서 남성장애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양정빈, 2015).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남성장애인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장애인보다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 (김승호, 외, 2016; 신승배, 2017). 높은 학력은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서경화, 황순영, 2022). 더 나아가 학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최아영, 홍서준, 2023).
장애유형의 경우, 내부·안면장애인에 비해 뇌변병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낮은 반면, 청각·언어장애인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높았다. 장애정도는 경증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신체적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생활의 독립성, 사회적 낙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뇌병변장애는 장애인의 보행, 언어, 일상생활 수행 등 여러 기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돌봄의 필요성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인은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 고립감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내부장애인은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건강문제, 피로감, 고통이 동반되며, 이해받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정서적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안면장애인은 외형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낙인, 시선 회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기 쉬우며, 대인관계 회피와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청각·언어장애인은 보조기기나 수화 등 대체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로 사회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지기능이나 신체기능이 보존된 경우가 많아, 교육·취업 등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종종 객관적 조건보다는 현재 환경이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 보호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김동화, 김미옥, 2015). 또한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나 욕구의 유형이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성취나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을 경험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Salkever, 2000). 하지만 본 연구애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내부·안면장애인에 비해 높아지는 장애유형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 부모나 보호자의 돌봄,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이전에 비해 양호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14). 장애정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이동, 자기관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의료비, 돌봄비용, 이동지원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고립이나 차별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박현숙, 2014).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장애수용과 장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수용과 장애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백수진 외, 2018; 이승연 외, 2021; 최수빈, 2024; Ditchman et al., 201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종단적 효과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이성적·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다(최수빈, 2024). 또한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다(Calhoun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장애수용과 장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수용과 장애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수용과 인지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초기 자원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 만성질환의 누적, 돌봄 자원의 부족,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Koon et al., 2020). 가령, 장애를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던 개인도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나 경제적 어려움, 돌봄 체계의 부재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할 경우 삶의 만족도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 제약과 반복적인 차별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심리적 자원의 소진(burnout)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Wolbring & Lillywhite, 2023). 이러한 점에서, 장애수용과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초기에는 두드러지지만, 장기적 삶의 경로에서는 점차 약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 요인에서는 감정표출을 많이 억제할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을 억제하면 내면의 분노, 슬픔, 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Kunzmann et al., 2014). 특히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 불편, 제약 등을 겪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할 경우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지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감정을 억제하면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가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감을 경험하여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Gross & John, 2003).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장애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적극적인 대처 자세 등이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노춘희, 2001; 주은선, 김희정, 2022).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Bandura, 1997). 또한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생존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의식은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Seligman, 2002).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으로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한다(김성희, 2016; 전동일, 양숙미, 2012). 높은 가구소득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여가, 소비, 교육, 건강, 재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편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의 편리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주 지역 환경이 좋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을 지지한다(김수봉, 고재욱, 2011; 오혜경, 백은령, 2003). 편리한 거주지역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 및 보행 환경, 엘리베이터,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성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2023).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가족과 주변인의 지지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경, 백은령, 2003; 이지수, 2007).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가족과 주변인의 지지는 장애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 소속감,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줄여주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할 수 있다(박자경, 엄명용, 2009).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 지지가 높은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의 지지는 장애인이 장애 발생 초기에 삶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애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주변인의 지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추가적인 지지가 가져오는 삶의 만족도 향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인은 취업, 자립, 건강 등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목표나 욕구를 갖게 되므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제공, 사회활동 참여와 같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중요해지며, 정서적 지지만으로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김두영, 2014). 이와 달리,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변인에 비해 가족은 장애인에게 더 지속적으로 진실되고 헌신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김현주, 조영희, 2024). 즉,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장애인의 변화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지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차별, 편견, 낙인, 사회적 배제 등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김자영, 한창근, 2016; 이선영, 2004; 이지수, 2011). 사회로부터의 분리감은 단순한 인식 차원이 아니라, 차별, 낙인, 배제의 경험이 내면화된 결과일 수 있다(김자영, 한창근, 2016).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질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삶을 살아갈 동기가 생길 수 있다(김지호, 이준수, 2019). 하지만 장애인이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면, 자신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며,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양정빈, 2015).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녀 장애인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맞춤형 대학 진학·직업 교육 프로그램, 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에서의 성 별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 할당제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생애 전환기(사별, 이혼, 부모 사망 등) 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노후 빈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상담, 자조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의 개념 및 특성, 장애인의 권리, 자기관리, 사회참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유형별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애로 인한 변화 수용,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재정의, 강점 발견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나 자기서사 작성, 자화상 그리기 등을 통해 자기 이해와 표현력 향상을 유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장애 발생 후기로 갈수록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초·중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장애 발생 후기에는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변화와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제하는 경향은 개인의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낙인, 감정 표현 이후의 부정적 반응 등 구조적 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Wechuli, 2023). 따라서 장애인이 심리적 안전감과 수용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감정 표현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관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통된 경험을 지닌 장애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감정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집단상담, 소규모 대화모임, 정서 지지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표현의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태도가 고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삶에 대한 목표 설정, 의사결정, 선택, 책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상된 자기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할 수행은 삶의 방향성과 지속적 노력을 유도하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 동료상담, 강연,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역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봉선, 2007).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결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포인트, 바우처,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이나 낮은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성취 압력을 부여하는 상황, 즉, 장애로 인한 강박이나 부자유 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문화 및 환경 조성이 함께 요구된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주변인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동아리, 멘토링, 생활조력자 배치 사업, 지역 기반 친구 맺기 캠페인 등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 형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커뮤니티 앱, 비대면 자조모임 등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지지망 형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주변인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초기에 비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초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로 갈수록 주변인의 정서적 지지 외에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에 기반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의 거주지역 편리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주거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실내 이동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비표준 단독주택 등의 개보수 지원 사업, 주거취약계층에게 월세·임대료를 보조하여 거주지 선택에 도움을 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거주시설 내 복지시설이나 병원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형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지역 병원의 무장애 인증제, 이동형 건강검진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장애인의 사회적 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공간적·사회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낙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따라서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설계 시 분리가 아닌 통합을 전제로 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design)이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 구조를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활동, 마을 축제, 공익 캠페인 등 공동 경험 기반의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하지만 2차 자료 활용으로 인해 변수 사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서열형 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를 전제로 하는 잠재성장모형의 주요 통계적 가정을 충족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적 요인 중 장애에 대한 인지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지 변수, 행동 요인 중 감정표출 억제와 삶에 대한 노력, 환경 요인 중 사회적 분리와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같은 변수들은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 의견과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변수들에 대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분리나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 변수는 환경 요인으로 설정되었으나, 외부환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 개인이 사회적 분리나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관점을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제도 및 정책 요인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복지, 고용,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경 요인의 결과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소득은 단일 제도나 정책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연구의 한계로서 인식하고, 향후 보다 정교한 제도 요인 측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주변인의 지지를 정서적 측면에서만 다루었는데, 경제적 도움, 정보 제공, 활동 보조 등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의 지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대리 응답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취업 여부는 본 연구에서 다룬 사회인지적 요인들의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김자영, 한창근, 2016; 박자경, 2009). 사회인지적 요인들이 장애인의 취업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같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해 보길 제안한다.
References
, , , , , , & (2006). Predictive variables on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stroke outpatients undergoing rehabilitation. Neuro Science, 27, 40-46. [PubMed]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PubMed]
, , , , & (2017). Symptom severity and life satisfaction in brain injury: The mediating role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social self-efficacy. NeuroRehabilitation, 40(4), 531-543. [PubMed]
, &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PubMed]
, , , & (2020). Aging concerns, challenges, and everyday solution strategies (ACCESS) for adults aging with a long-term mobility disability.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3(4), 100936. [PubMed]
, &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PubMed]
, & (2001). Enhanced self-determination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s an outcome of moving to community-based work or living environment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5(5), 371-38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4-05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7-3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8-20

- 988Download
- 219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