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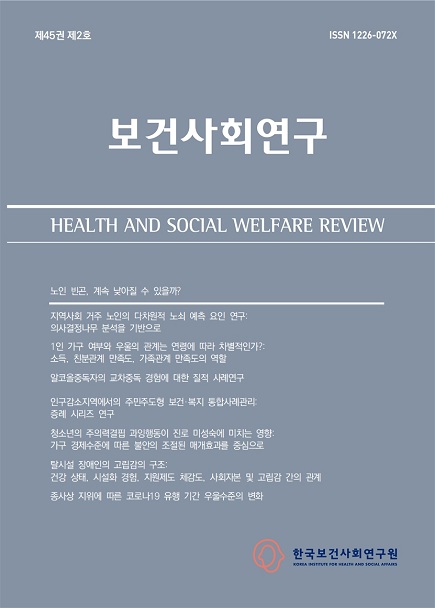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의 구조: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 간의 관계
The Structure of the Sense of Isolation Among Deinstitutionalized Disabled Peopl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Institutionalization Experience, Perception of Support Systems, Social Capital, and Isolation
Jeon, Geun Bae1; Jo, Han-jin2*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122-147,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12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살다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고립감의 원인과 경로를 찾기 위해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고립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가 고립감에 영향을 주었다. 시설화 경험이 높을수록 탈시설 이후 지원제도 체감도가 낮았으며, 지원제도 체감도가 낮을수록 사회자본은 낮고 고립감은 높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장애인이 시설화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탈시설 이후 시설화 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 sense of isolation, which was reported to be the main difficulty that deinstitutionalized disabled people experienced in the community after leaving institutions, based on Bourdieu's capital theory, and established key variables—such as health status, institutionalization experience, perception of support systems, and social capital—and verified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September 10, 2023, through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conducted by trained interviewers. A total of 365 deinstitutionalized disabled people aged 18 and older participated in the survey. Our analysis used data from 310 people, excluding outliers, missing values, and insincere respons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inal research model was 55.9% for perception of supp ort systems, 90.7% for social capital, and 46.8% for isolation. Out of 17 hypotheses tested, 11 were suppor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health status of deinstitutionalized disabled peopl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erception of support systems, social capital, and isolation. Past experience of living in an institutional sett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erception of supp ort systems and social capital. In addition, perception of support system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capital and isolation. Health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ed living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effects on social capital and isolation. Ultimately, this study challenges the common belief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loneliness simply because they have left institutions, and reveals a structural pathway through which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ed living diminishes perception of national systems, which in turn deepens a sense of isolation.
초록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는 고립감을 Bourdieu의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이라는 주요 변인을 설정하고 그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자료는 2023년 6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 교육된 면접원과의 1:1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에는 만 18세 이상의 탈시설 장애인 36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상치, 결측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1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지원제도 체감도 55.9%, 사회자본 90.7%, 고립감 46.8%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총 17개의 가설 중 11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고립감에, 과거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에 각각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제도 체감도는 사회자본과 고립감에 각각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와 시설화 경험이 사회자본과 고립감에 끼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통념을 반박하며, 시설화 경험이 국가 제도의 체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경로를 밝히고 있다.
Ⅰ. 서론
한국 정부는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발효 이후 인권 모델에 기초한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자율성,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등을 다루고 있는 협약 전문 및 일반원칙, 여타 조항들과 폭넓게 관계되어 있기에, 정부는 점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탈시설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립감(sense of isolation)은 탈시설 장애인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철, 김경미, 2017; 김정현, 2021; Macdonald et al., 2018). 고립감 관련 연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접촉, 사회적 연결, 상호작용의 위기를 주요하게 다루어왔다(최지현 외, 2022). 고립감은 한 사람의 생물학적 생존에서부터 사회적 삶의 영위에 이르기까지 널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령, 고립감은 건강 위험 행동(Shankar et al., 2011),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Valtorta et al., 2018), 치매(이상철, 2017), 사망률(HoltLunstad et al., 2015)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인식(KelleyMoore et al., 2006)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는 고립감에 관한 연구 전반이 부족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관심이 적었다. 고립감에 대한 개념화와 실증 연구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95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다 보니(김옥수, 1997), 국내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고립감을 보고하고 있으나(Macdonald et al., 2018), 한국은 주요 통계에서 장애인의 고립감을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실정이다(강대선 외, 2021). 둘째, 그간 탈시설에 관한 국내 다수의 연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실태(조한진 외, 2012)나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에 방점을 두어왔다(박숙경 외, 2017). 이는 연구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탈시설 정책의 초창기 국가에 속하는 국내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대한 적절한 규명이 없는 가운데, 그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원인이 탈시설 그 자체, 즉 시설을 나왔기 때문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시설 재입소를 추진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4). 이에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의 원인과 경로를 살핌으로써 탈시설 정책의 보완점을 도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고립감은 한 인간의 주어진 사회적‧정서적 연결에 따라 수반되는 관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Tarvainen, 2020). 그러나 고립감 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손상이나 고립감의 결과로써 나타난 정신적 손상 등을 장애와 관련지어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었다(Macdonald et al., 2018). 이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립감이 개인의 병리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을 공유하여 과도하게 원인을 개인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이 경험하는 관계적 현상으로서 고립감을 설명하기 위해 Bourdieu의 자본 이론과 아비투스(habitus) 개념에 주목하여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이라는 주요 변인과 가설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면서, 동시에 고립감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닌 장애의 개인화를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일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Ⅱ. 문헌 고찰
1. Bourdieu의 자본 이론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의 이해와 관련 변인의 설정
Bourdieu는 인간의 행위나 생활방식을 자본, 아비투스, 장(field)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였다(이성희, 2013). 전통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자본만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동원하는 모든 수단을 자본으로 이해하여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한 Bourdieu는 이 자본의 불균등한 양과 구조가 개인이 어디에 위치 지어질 것인지 그 장을 결정하며 그렇게 ‘주어진’ 장에 배치된 인간이 장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생활방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Bourdieu는 자본의 범주를 다원화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바탕을 둔 구조주의적 전통의 입장에서 계층의 생활 양식론에 초점을 두는 베버리즘적 전통으로의 확장을 의도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와 개인 간의 이분법적 관점과 환원주의적 분석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소정 외, 2008).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자본은 경제적‧문화적‧사회적‧상징적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상이한 종류의 자본은 ‘상호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을 갖는다(Bourdieu, 1986). 경제자본이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으로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착취관계를 다룬다면, 문화자본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계급 재생산의 방식을 설명하며, 사회자본은 관계의 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화된 관계를 나타내고, 상징자본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계급 재생산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복종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다(김갑수, 2019). 인간은 자본의 종류와 양에 따라 관계적으로 구별되는 위치를 갖게 되며, 그 결과로 현실적 조건에 배치된 인간은 선천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특정한 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독특한 생활방식을 형성한다. Bourdieu가 인간 행위의 무의식적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아비투스는 인간의 행위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직하여 ‘체계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이자, 그 결과를 내재화하여 ‘체계화된 구조(structured structure)’인 것이다(Bourdieu, 1984, p. 170).
공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구별 짓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그를 바탕으로 형성하는 또는 형성된 아비투스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감각이자 타자에 대한 위치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정, 윤재은, 2021). 그렇다면 시설(institution)은 한 사회의 자본이 그의 정당성 확보와 재생산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할당하여 구획한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는 주로 그 대상이 된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인간이 그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위치, 그리고 세계를 감각함으로써 세계의 규범을 체화하는 과정이자 체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은 ‘시설’이라는 ‘장(場)’으로부터 퇴소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장에서 ‘시설화’라는 아비투스를 역사적으로 형성해 왔던 사람인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개인이 지닌 주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장애 관련 연구에서 기본값처럼 다루어 온 신체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1), ‘시설화 경험’을 주요 변인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는 여전히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이라는 ‘장’은 퇴소할 수 있을지언정, 체화된 시설화 경험이 물리적 공간 이동과 함께 퇴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또한 퇴소한 시설에서보다 지역사회라는 ‘장’이 더 유리한 자본을 형성‧획득하고 세계와 교섭‧투쟁할 수 있는 환경을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자본의 상호 전환성을 높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설화의 경험을 더 이상 연장 혹은 심화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아비투스 개념과 Butler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종합하여 ‘체화된 사회자본(embodied social capital)’을 제시한 Holt(2008)는 개인들이 서로 경계가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주체라기보다 상호 관계적인 맥락 안에서 개인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장애인은 그들이 인식하고 그들을 인식하는 사회 공간의 맥락에서 장애인으로 되며, 이러한 ‘되는’ 과정에 있는 개인의 사회적 만남은 체화되어 미래의 사회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Holt, 2008, p. 238).
지역사회라는 장에서 동등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탈시설 장애인이 완전히 통합되어 뿌리내리는 정도와 관련된다. 이는 서로 간의 친분과 인정으로 형성되는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즉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과 물질적 또는 상징적으로 교환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자격이자 소속 안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인 사회자본의 정도를 뜻한다(Bourdieu, 1986). 그러나 탈시설 장애인은 애초 시설로 대표되는 장을 할당받아 제한된 사회자본을 형성해 왔거나 그 기회를 제약당하여 왔기에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라는 변화된 장에 위치하더라도 자원을 획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전통적인 자본과는 달리 ‘소유’가 아닌 ‘활용’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사회자본은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지 및 재생산될 수 있고(소진광, 2004; Bourdieu, 1986), 그 총량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Putnam, 1993).
따라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으로부터의 누적된 배제가 불러온 공백을 채우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상이한 종류로의 자본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게끔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위적 개입이며, 이는 보통 국가(제도)의 역할이 된다. 채오병(2018)은 Bourdieu의 관점에서 상징 권력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즉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국가를 통한 여러 지원제도는 탈시설 장애인이 인식함으로써 실재하는 국가의 모습이며 효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을 병리적‧심리적 현상이 아닌 관계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이 연구에서는 Bourdieu의 이론 중 시설이라는 장과 지역사회라는 장에서 일어나는 상호 연결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자본’을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을 향한 투쟁의 맥락을 살필 수 있도록, 사회에 의한 비교적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의 사회자본과 더불어 국가에 의한 비교적 인위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제도 체감도’를 변인으로 함께 검토하였다.
2. 관련 변인 간의 관계와 가설의 채택
가. 고립감 및 관련 변인 간의 직접효과
건강 상태와 고립감 간의 유의한 관계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CantareroPrieto et al.(2018)에 의하면 각종 만성질환 등의 건강 상태가 사회적 관계와 사회참여를 제약하여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 박연환과 강희선(2008)도 개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분석하였다.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고지영 외(2016)에 따르면 건강 취약 집단은 건강 양호 집단에 비해 주거 접근성, 편리성 등에서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건강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지원제도 체감도가 낮은 상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 만족도에 대한 주거비 부담률의 영향에서도 건강 상태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며(박재영, 2018), 의료지원 측면에서도 만성질환을 보유한 개수가 많을수록,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존재한다(문정화, 강민아, 2016; 최경화 외, 2021).
건강 상태는 사회자본과도 영향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건강 상태는 낮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예측한다. 김기태(2022)는 건강 배제 집단이 비배제 집단에 비하여 사회자본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배제 집단 내에서도 배제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자본이 낮게 나타났다(Pevalin & Rose, 2003).
다음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과 고립감의 관계는 여러 질적 연구와 일부 양적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탈시설 장애인은 퇴소 이후 친밀한 관계를 사귄 경험이 없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불안을 느끼며(최문정, 2011), 자유롭지만 혼자서 시간을 주로 보내는 생활에 대해 양가감정을 경험한다(성명진, 2019).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외로움(김민희, 2019), 의지할 곳 없이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감내해야 하는 쓸쓸함과 고립감(김정현, 2021)을 겪기도 한다. 심석순 외(2010)는 생활시설 내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이 긍정적 자존감 형성에는 부적 영향을,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퇴소 이후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설이라는 장으로의 입소와 생활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시설화가 퇴소 이후에도 일종의 관계적 흔적을 남긴다고 유추할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은 시설 퇴소 이후 국가 지원제도 체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설은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지역사회가 아닌 특정 공간에 통합하여 설계해 온 공간이었기에 그 안에서 시설화된 사람들은 특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나 자신이 주도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시설이라는 제도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장애인은 그에 의해 부양될 뿐이기에, 장애인은 ‘나를 위한다’ 며 행해지는 일들로 인해 나에게서 소외된다. 탈시설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김민철, 김경미, 2017), 활동지원 급여 신청 후 종합조사를 받을 때에는 부적절한 판정 체계로 인해 ‘파리목숨’과 같은 처지의 자신을 경험하며, 활동지원사에게서 보조를 받을 때면 “아들 같아서” 또는 “딸 같아서”, “[거기] 가서 뭐 하게”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시설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통제와 억압을 겪는다(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 지원제도 체감도가 개인마다의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인지 도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정홍원 외, 2016), 탈시설 이후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주거, 일상생활, 의료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장애인 지원제도들에 대한 인식은 비단 양적‧질적 적절성만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등 불평등이 사회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정세정 외, 2021), 시설화 경험 그 자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시설화 경험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국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활 실태, 차별, 학대‧폭력과 같은 불평등이 사회자본 또는 그와 유사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는 있다. 장애인의 시설 입소는 가족 관계의 일정한 단절로 이어지는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경우가 무연고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강정배 외, 2020), 외부 가족과의 교류는 12개월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두절되거나 원활해지지 않는다(조한진 외, 2012). 이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시설 내에서 정형화 되고 무료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관계와 활동을 경험하며, 시설 외부와의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된다 (김민철, 김경미, 2017; 조한진 외, 2017).
한편, 이 연구는 탈시설 이후 경험하는 국가 지원제도 체감도가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였다. 이현지(2012)에 의하면 재가 노인의 월 소득은 고립감, 외로움, 통제감, 삶의 만족도, 우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주거의 경우에도 거주하는 집의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 주거환경에 부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 증상이나 고독감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존재한다(백옥미, 2020; 이정미, 김주일, 2021). 또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우울을 포함한 삶의 질이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다(이정욱, 2020).
나아가 이 연구는 국가 지원제도 체감도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2) 박종민과 김왕식(2006)은 국가기관의 공정성, 정책의 형평성, 제도의 민주성 등을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뢰가 높게 나타나 국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Ferragina(2017)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유럽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의 관대함과 사회자본 사이에 부정적 연관성보다는 긍정적 연관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Kumlin과 Rothstein(2005)은 스웨덴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 기관과의 만남은 사회 신뢰를 높이는 반면에 ‘욕구를 시험하는(needstesting)’ 사회적 프로그램의 경험은 사회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복지국가 또는 어떤 복지제도인가에 따라 사회자본의 형성이 촉진되거나 저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형용과 백옥미(2021)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며 적절한 주거 지원 정책이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이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형성‧획득하고 있는 연결의 상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전제한다. 가령, 가족 및 사회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장애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임수경, 2019), 가족 지지와 타인 지지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정은혜, 윤명숙, 2018).
나.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의 간접효과
Bourdieu와 같이 자본을 지배계급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기제로 이해하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제도는 상징 권력인 국가의 행위로서 자본이 생성되어 확장되는 발현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회의 여러 제도는 치열한 상징 투쟁과 분류 투쟁을 거치며 부과된 것으로, 상징 권력인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도록 작동하는 장치인 것이다(채오병, 2018).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원제도 체감도가 탈시설 장애인의 실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건강 상태, 신체에 박혀 실재가 되어 현재의 세계에 상호작용하는 시설화 경험, 그의 영향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이라는 관계적 산물, 고립감이라는 관계적 현상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하고 있는 인지 도식에 따른 주관적 평가인 지원제도 체감도는 객관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어 이를 조절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지원제도 체감도와 동일한 변인을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어, 건강 상태와 사회자본, 시설화 경험과 사회자본, 건강 상태와 고립감, 시설화 경험과 고립감 간의 관계에서 지원제도 체감도가 지니는 매개효과는 국가적 제도와 관계된 유사 변인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보다 넓게 검토함으로써 유추하였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변인과 사회자본 관련 유사 변인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제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드물게 보고되어 왔다. 임인걸과 김욱(2013)은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정도와 직업 활동 간의 관계에서 의료재활 서비스와 사회재활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박경수와 이석호(2015)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수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이에 직업 활동이나 자발적인 수급 탈피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같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로의 참여와 상호작용 기회의 확대에 정부의 지원제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불리함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고립감과 같은 사회적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중요함을 실증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동배 외(2012)는 노인의 주거 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윤진 외(2013)는 50대 이상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노후 준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건강 상태와 고립감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건강 상태와 고립감, 사회 자본 및 유사 변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조성희(2019)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행위가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 참여 수준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오영은과 이정화(2015)는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고독감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와 참여의 사회자본이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잠재 변인은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및 고립감인데, 잠재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 실증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가설 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탈시설 장애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시설 형태 외에 현존하는 주거지인 전환주거‧지원주거‧독립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다(오욱찬 외, 2021).3) 연구 참여자는 조사 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기타 집단거주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퇴소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 본인이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 설문 내용의 이해가 가능하며 면담 진행에 협조가 가능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데이터가 부재하여 접근이 가능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 방법과 횡단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확률표집 방법 중 유의표집과 편의표집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연구윤리 심의와 승인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IRB 승인 번호 1040621202301HR001).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와 응답을 위하여 면접 설문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면접원이 연구 참여자를 만나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신청한 참여자에게는 질문 이해와 응답에 도움을 줄 면접원 총 127명을 배치하였다. 면접원은 모두 각 지역에서 직접 동료 상담, 사회복지 업무 등에 종사하며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이들로, 사전에 연구의 취지, 설문지의 내용, 조사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은 2023년 5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원의 거주지, 인원수, 일정을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총 20회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은 2023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47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365명(77.3%)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이상치, 결측치, 불성실 응답 55명을 제외한 310명의 자료를 최종 사용하였다. 이상치는 자료의 산점도와 사분위수 범위의 1.5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 항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유급 노동 여부, 결혼 여부, 생활권역, 탈시설 기간, 총 시설생활 기간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문항과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고립감은 개념이 지니는 다차원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작성한 예비 문항은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 4명,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옹호자 2명, 탈시설 장애인 지원자 3명, 알기 쉬운 자료 제작자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이를 최종 반영하였다.
가. 고립감
고립감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정서적 연결의 적절성에 따라 느끼는 비자발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립감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내에서 인식하는 홀로됨인 사회적 고립감과 관계 밖에서 평가하는 자신의 관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정서적 외로움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도구인 UCLA 외로움 척도(3판)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진은 주, 황석현, 2019), DeJong Gierveld의 외로움 척도(DeJong Gierveld & Kamphuis, 1985),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아동(오현미, 2000), 청소년(허정화, 김진숙, 2014) 대상 외로움 척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 접근이 용이하도록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응답의 선택지를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는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감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적 고립감 5개 문항(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정서적 외로움 4개 문항(예: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함을 느낀다’)으로 이루어진 고립감 조사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5로 나타났다.
나.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건강의 맥락에서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건강 상태는 본인이 인식하는 신체 건강의 상태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교적 객관적인 유기체적 상태인 만성질환의 수라는 두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를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김성희 외, 2017; 정영호 외, 2013). 주관적 건강상태(1개 문항)는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수(1개 문항)와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시설화 경험
시설화 경험은 과거 시설 입소와 시설에서의 생활 과정 전반에서 경험한 구조적‧관계적 맥락의 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설화 경험은 제도적‧물리적 차원에서 시설로의 입소 과정과 시설 환경에 대한 경험인 구조적 시설화,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행위자와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겪는 관계적 시설화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에서는 유동철 외(2013)가 분류한 국내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징적 문화 네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서비스 운영구조 자체가 지닌 특징으로 나타난 비선택성과 집단성을 구조적 시설화로 명명하였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격리성과 권력 불평등성을 관계적 시설화로 이름 붙였다. 이 두 하위 요인의 측정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반복 활용되어 온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강상경 외, 2020; 심석순, 2010; 조한진 외, 2017). 설문 응답 접근이 용이하도록 응답의 선택지를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의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문항을 배치 하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화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조적 시설화 7개 문항(예: ‘내가 정말 원해서 시설에 들어갔다’), 관계적 시설화 11개 문항(예: ‘시설 직원에게 허락받지 않은 일은 할 수 없었다’)으로 이루어진 시설화 경험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821로 나타났다.
라. 지원제도 체감도
지원제도 체감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그 잠정적 또는 실제적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하고 있는 인지 도식에 따라 내린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원제도 체감도는 공적이전소득 지원 체감도, 주거지원 체감도, 활동지원 체감도, 의료지원 체감도라는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도로의 접근 용이성, 필요 대비 유용한 도움의 정도, 급여나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 정부의 해당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체감도의 관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측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강신욱 외, 2011; 강혜규 외, 2010, 고광영 외, 2016; 김성희 외, 2017; 김현지 외, 2021).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특성상 응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역문항은 지양하였다. 문항의 합산한 점수가 높을 수록 지원제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공적이전소득 지원 체감도 3개 문항(예: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달 수급비는 생활하기에 충분하다’), 주거지원 체감도 3개 문항(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의 내부는 장애인이 살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활동지원 체감도 3개 문항(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충분하다’), 의료지원 체감도 4개 문항(예: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장애인의 장애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으로 이루어진 지원제도 체감도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854로 나타났다.
마.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한 사람이 지역사회 환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자신의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탈시설 장애인이 퇴소 이후 지역사회라는 장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회 신뢰의 정도, 관계의 정도, 호혜 규범의 정도, 사회참여의 정도라는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민주(2019)가 개발한 ‘한국형 노인 사회자본 척도(Korean Elderly Social Capital Scale)’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척도에 역문항이 별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동일하게 역문항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 신뢰의 정도 2개 문항(예: ‘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믿는 편이다’), 관계의 정도 4개 문항(예: ‘나는 여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호혜 규범의 정도 4개 문항(예: ‘길에서 돈을 줍는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참여의 정도 3개 문항(예: ‘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편이다’)으로 이루어진 사회자본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743으로 나타났다.
바. 통제 변인
선행연구의 검토에 따라 고립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중 자료를 통해 유의한 관계가 예상되는 통제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인으로는 성별(남성 1), 연령, 정신적 장애 동반 여부(동반 1), 학력(중졸 이하 1), 유급 노동 여부(유급 노동함 1), 연락하는 가족 유무(유 1), 생활권역(수도권 및 광역시 1), 최초 시설 입소 연령, 총 시설생활 기간, 탈시설 기간, 현재 주거유형(독립주거 1)을 고려하였다. 현재 배우자 유무와 장애 정도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분석 시에는 제외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jamovi 2.3.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7을 활용하여 측정 모형 및 구조 모형의 분석을 하였다. 잠재 변인인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 고립감은 하위 요인이 또 다른 하위 변인으로 각각의 개별 문항들을 갖고 있어 ‘문항 묶음(item parcel)’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MIN(minimum chi-square)/df,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값을 통해 검증 및 수정하였으며, 최종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의 팬텀 변인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은 61.6%, 여성은 38.4%였고, 평균 연령은 약 45.4세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N=310)
| 구분 | n | % | M±SD | 구분 | n | % | M±SD | ||
|---|---|---|---|---|---|---|---|---|---|
| 성별 | 남 | 191 | 61.6 | 현재 배우자 유무 | 유 | 15 | 4.9 | ||
| 여 | 119 | 38.4 | 무 | 295 | 95.1 | ||||
| 연령 | 39세 이하 | 102 | 32.9 | 45.4±12.3 | 연락하는 가족 유무 | 유 | 144 | 46.5 | |
| 40세~59세 | 170 | 54.8 | 무 | 166 | 53.5 | ||||
| 60세 이상 | 38 | 12.3 | 생활권역 | 수도권/광역시 | 248 | 80.0 | |||
| 주 장애 유형 | 지체장애 | 31 | 10.0 | 기타 시도 | 62 | 20.0 | |||
| 뇌병변장애 | 114 | 36.8 | 최초 입소 연령 | 18세 이하 | 198 | 63.9 | 15.7±13.4 | ||
| 시각장애 | 2 | 0.6 | 19세 이상 | 112 | 36.1 | ||||
| 청각장애 | 2 | 0.6 | 총 시설생활 기간 | 10년 이하 | 51 | 16.5 | 23.5±12.6 | ||
| 신장장애 | 1 | 0.3 | 11년~20년 | 85 | 27.4 | ||||
| 뇌전증장애 | 1 | 0.3 | 21년~30년 | 89 | 28.7 | ||||
| 지적장애 | 140 | 45.2 | 31년 이상 | 85 | 27.4 | ||||
| 정신장애 | 19 | 6.2 | 탈시설 기간 | 2년 이하 | 64 | 20.7 | 6.2± 6.1 | ||
| 정신적 장애 동반 여부 | 동반 | 190 | 61.3 | 3년~4년 | 83 | 26.8 | |||
| 비동반 | 120 | 38.7 | 5년~6년 | 53 | 17.1 | ||||
| 장애 정도 | 중증 | 306 | 98.7 | 7년~8년 | 46 | 14.8 | |||
| 경증 | 4 | 1.3 | 9년 이상 | 64 | 20.6 | ||||
| 학력 | 중졸 이하 | 156 | 50.3 | 현재 주거유형 | 독립주거 | 191 | 61.6 | ||
| 고졸 이상 | 154 | 49.7 | 전환주거 | 70 | 22.6 | ||||
| 유급 노동 여부 | 노동함 | 160 | 51.6 | 지원주거 | 41 | 13.2 | |||
| 노동하지 않음 | 150 | 48.4 | 기타 | 8 | 2.6 | ||||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45.2%로 가장 많았고, 등록된 주 장애 유형 또는 부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61.3%였다. 장애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이하, ‘중증’으로 표기) 장애인이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50.3%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녔으며, 유급 노동을 하는 경우는 51.6%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95.1%로 나타났으며, 53.5%는 연락하는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80.0%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생애 최초로 시설에 입소한 연령은 평균 약 15.7세로 나타났는데, 만 18세 이하에 최초 시설 입소를 한 경우가 63.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소한 이후 시설에서 생활한 총 기간은 평균 약 23.5년이었으며, 83.5%는 11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탈시설 기간은 평균 약 6.2년으로 나타났으며, 79.3%가 탈시설한 지 3년 이상이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본인 명의의 독립주거인 경우가 61.6%로 가장 많았다.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잠재 변인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건강 상태의 평균은 2.36점(SD=1.22)으로 나타났고, 시설화 경험의 평균은 3.01점(SD=0.47)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결과(N=310)
| 잠재 변인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 독립변인 | 건강 상태 | 0.50 | 8.50 | 2.36 | 1.22 | 1.14 | 2.56 |
| 시설화 경험 | 1.61 | 4.00 | 3.01 | 0.47 | -0.04 | -0.25 | |
| 매개변인 | 지원제도 체감도 | 1.08 | 3.92 | 2.49 | 0.56 | -0.07 | -0.32 |
| 사회자본 | 1.46 | 3.85 | 2.85 | 0.43 | -0.17 | -0.05 | |
| 종속변인 | 고립감 | 1.00 | 4.00 | 2.41 | 0.56 | 0.01 | -0.16 |
지원제도 체감도의 평균은 2.49점(SD=0.56), 사회자본의 평균은 2.85점(SD=0.43)으로 나타났다. 고립감의 평균은 2.41점(SD=0.56)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를 제외한 잠재 변인의 척도가 1~4점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화 경험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이 0.01~1.14로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도 0.05~2.56으로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되었다(Kline, 2011).
이어 잠재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건강 상태와 시설화 경험(r=.200, p<.05), 건강 상태와 고립감(r=.566, p<.001), 시설화 경험과 고립감(r=.282, p<.01),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r=.889,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 상태와 지원제도 체감도(r=-.385, p<.001), 건강 상태와 사회자본(r=-.545, p<.001), 시설화 경험과 지원제도 체감도(r=-.606, p<.001), 시설화 경험과 사회자본(r=-.666, p<.001), 지원제도 체감도와 고립감(r=-.482, p<.001), 사회자본과 고립감(r=-.419,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구분 | 건강 상태 | 시설화 경험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 |
|---|---|---|---|---|
| 시설화 경험 | .200* | |||
| 지원제도 체감도 | -.385*** | -.606*** | ||
| 사회자본 | -.545*** | -.666*** | .889*** | |
| 고립감 | .566*** | .282** | -.482*** | -.419*** |
3. 연구 질문의 검증
가.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수정
측정 모형 분석은 잠재 변인과 관측 변인 간, 잠재 변인과 잠재 변인 간의 관계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에 14개의 관측 변인이 잠재 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측정 모형의 타당도,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절대 적합지수는 CMIN, RMSEA, SRMR로 판단하고, 이론 모형이 변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독립 모형에 비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상대 적합지수는 CFI와 TLI를 통해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먼저 가설 모형의 잠재 변인을 모두 포함한 측정 모형의 CMIN은 228.578, 유의수준은 p<.001로 p>.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MIN은 표본의 크기가 통상 300 이상인 경우에 두 공분산행렬 간의 차이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도 표본 크기로 인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CMIN 이외의 적합도로도 판단하였다. CMIN 이외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88, SRMR=.070, CFI=.865, TLI=.816으로 나타나, 절대 적합지수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상대 적합지수는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활용하여 측정 모형을 수정하였는데, 수정 지수 값이 큰 순서로 ‘관계의 정도’와 ‘호혜 규범의 정도’, ‘관계의 정도’와 ‘사회참여의 정도’의 측정오차 간의 상관관계 경로를 추가하였다. 사회자본이 관계 안에서, 관계에 의해,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관계의 정도는 사회자본의 각 하위 요인과 일정한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호혜 규범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그 안에서 특정하게 일어나는 활동의 안정과 유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관계는 사회 참여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현, 정문기, 2019). 수정 결과, 수정 모형의 CMIN은 184.741, 유의수준은 p<.001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77, SRMR=.062, CFI=.900, TLI=.859로 양호하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 수정된 측정 모형은 연구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나.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수정
측정 모형의 검증 이후 가설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수 추정은 AMOS를 활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정신적 장애 동반 여부, 학력, 유급 노동 여부, 연락하는 가족 유무, 생활권역, 최초 시설 입소 연령, 총 시설생활 기간, 탈시설 기간, 현재 주거유형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구조 모형을 추정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CMIN은 413.577, 유의수준은 p<.001로 나타났으며, RMSEA=.069, SRMR=.052, CFI=.897, TLI=.816으로 나타나 절대 적합지수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상대 적합지수는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잠재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시설화 경험 → 고립감, 사회자본 → 고립감)를 제거하고, 수정 지수 값을 이용하여 측정 모형에서와 같이 측정오차 간 상관관계 경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CMIN=348.429, 유의수준은 p<.001로 나타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62, SRMR=.049, CFI=.916, TLI=.850으로 나타나 가설 모형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수정 모형을 최종 연구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제곱 값인 ‘다중 상관 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지원제도 체감도 55.9%, 사회자본 90.7%, 고립감 46.8%로 나타났다.
다. 최종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검증
최종 연구 모형에서 잠재 변인 간 직접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검증 결과, 첫째, 탈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지원제도 체감도 수준에 대해 시설화 경험(ß=-.520, p<.001), 건강 상태(ß=-.227, p<.01)는 각각 유의한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시설 생활 당시 시설화 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낮지 않을수록 지원제도 체감도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둘째,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 수준에 대해 지원제도 체감도(ß=.608, p<.001), 시설화 경험(ß=-.250, p<.05), 건강 상태(ß=-.249, p<.01)는 각각 유의한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시설 이후 지원제도 체감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과거 시설 생활 당시 시설화 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낮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대해 지원제도 체감도(ß=-.426, p<.001), 건강 상태(ß=.416, p<.001)는 각각 유의한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낮을수록 고립감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표 4
최종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Estimate | S.E. | C.R. (B/S.E.) | |||
|---|---|---|---|---|---|---|
| B | β | |||||
| 건강 상태 | → | 지원제도 체감도 | -0.161 | -.227 | 0.054 | -2.995** |
| 시설화 경험 | -0.630 | -.520 | 0.101 | -6.217*** | ||
| 건강 상태 | → | 사회자본 | -0.082 | -.249 | 0.030 | -2.700** |
| 시설화 경험 | -0.141 | -.250 | 0.061 | -2.308* | ||
| 지원제도 체감도 | 0.283 | .608 | 0.069 | 4.125*** | ||
| 건강 상태 | → | 고립감 | 0.250 | .416 | 0.071 | 3.503*** |
| 지원제도 체감도 | -0.361 | -.426 | 0.092 | -3.941*** | ||
최종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의 팬텀 변인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였으며, 신뢰도를 상한‧하한 9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표준화 계수는 잠재 변인 간 직접효과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이르는 경로(ß=-.138, p<.01), 시설화 경험이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이르는 경로(ß=-.316, p<.001), 건강 상태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고립감에 이르는 경로(ß=.096, p<.01), 시설화 경험이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고립감에 이르는 경로(ß=.222, p<.001)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표 5
최종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Estimate | S.E. | Bias-corrected | ||
|---|---|---|---|---|---|
| B | β | Lower | Upper | ||
| 건강 상태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 | -0.046 | -.138** | 0.026 | -.090 | -.017 |
| 시설화 경험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 | -0.178 | -.316*** | 0.066 | -.288 | -.106 |
| 건강 상태 → 지원제도 체감도 → 고립감 | 0.058 | .096** | 0.034 | .021 | .116 |
| 시설화 경험 → 지원제도 체감도 → 고립감 | 0.228 | .222*** | 0.081 | .129 | .355 |
이상으로 최종 연구 모형에서 잠재 변인 간의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에서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건강 상태(ß=.512, p<.001), 지원제도 체감도(ß=-.426, p<.001), 시설화 경험(ß=.222, p<.001)으로 파악되었다. 건강 상태의 낮음 정도는 고립감에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쳤으며(ß=.416, p<.001), 지원제도 체감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쳐 (ß=.096, p<.01)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원제도 체감도는 고립감에 부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426, p<.001). 시설화 경험은 직접적으로 고립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지원제도 체감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ß=.222, p<.001)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최종 연구 모형의 총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 효과 | ||
|---|---|---|---|---|---|
| 건강 상태 | → 지원제도 체감도 | -.227** | -.227** | ||
| → 사회자본 | -.249** | -.387*** | |||
| → 지원제도 체감도 | → 사회자본 | -.138** | |||
| → 고립감 | .416*** | .512*** | |||
| → 지원제도 체감도 | → 고립감 | .096** | |||
| 시설화 경험 | → 지원제도 체감도 | -.520*** | -.520*** | ||
| → 사회자본 | -.250* | -.566*** | |||
| → 지원제도 체감도 | → 사회자본 | -.316*** | |||
| → 지원제도 체감도 | → 고립감 | .222*** | .222*** | ||
| 지원제도 체감도 | → | 사회자본 | .608*** | .608*** | |
| → | 고립감 | -.426*** | -.426*** |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원제도 체감도(ß=.608, p<.001), 시설화 경험(ß=-.566, p<.001), 건강 상태(ß=-.387, p<.001)이었다. 지원제도 체감도의 수준은 사회자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608, p<.001). 시설화 경험의 수준은 사회자본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끼쳤으며 (ß=-.250, p<.05), 지원제도 체감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적 영향을 끼쳐(ß=-.316, p<.001)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 상태의 낮음 정도는 사회자본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끼쳤으며(ß=-.249, p<.01), 지원제도 체감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적 영향을 끼쳐(ß=-.138, p<.01)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라. 가설 검증의 최종 결과
이 연구는 Bourdieu의 자본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을 바탕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 사회자본을 가정하고 변인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의 권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잠재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수정 지수 값의 크기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관측 변인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추가하여 수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 수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연구 모형은 가설 6(시설화 경험 → 고립감)과 가설 9(사회자본 → 고립감)를 기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가설 12(건강 상태 → 사회자본 → 고립감), 가설 13(건강 상태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 → 고립감), 가설 16(시설화 경험 → 사회자본 → 고립감), 가설 17(시설화 경험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 → 고립감)을 기각하였다. 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직접효과의 경우에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간접효과의 경우에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 17개의 가설 중 11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6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7
최종 연구 모형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 구분 | 결과 |
|---|---|
| 건강 상태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1.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2.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사회자본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3.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고립감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시설화 경험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4.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5.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사회자본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6.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고립감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지원제도 체감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7.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는 사회자본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8.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는 고립감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사회자본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9.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고립감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건강 상태로부터 간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10.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1.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2.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3.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을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시설화 경험으로부터 간접 영향을 받는 변인 | |
| 가설 14.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5.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6.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 가설 17.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을 매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지지 |
Ⅴ.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논의
최종 연구 모형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상태, 지원제도 체감도, 시설화 경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화 경험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 상태와 시설화 경험은 모두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에 각각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건강 상태와 사회자본, 시설화 경험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지원제도 체감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지지한 가설과 기각한 가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지원제도 체감도(가설 1), 사회자본(가설 2), 고립감(가설 3)에 각각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가설 10), 마찬가지의 경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11). 이는 건강 상태가 낮을수록 높은 고립감을 보고하며(박연환, 강희선, 2008),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최경화 외, 2021; Pevalin & Rose, 2003).
그러나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건강이 독립변인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현재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상태 역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기월(1999)에 의하면 시설 노인과 재가 노인 집단 간의 ADL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현혜진 외(2012)는 시설 노인이 재가 노인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시설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재가노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Emerson과 Hatton(1996)은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보고된 46개 연구를 분석하여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활동 참여의 증가, 적응행동의 증가, 도전 행동의 감소, 의료진 접촉의 증가 등을 나타낸다고 밝혔고, Chowdhury와 Benson(2011)은 탈시설 이전과 이후 삶의 질 비교 연구를 살펴 상호작용의 증가, 외출의 증가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와 별도 공간에서의 보호라는 사회적 조치가 해당 시대의 산업화와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 과정이나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통치의 성격‧방식과 관련되어 왔다는 점(김명연, 2016), 장애에 대한 편견의 사회적 풍조와 관행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의 지출이 낮고 시설에 투자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Friedman, 2019) 등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응하는 시설의 사회적 배경을 나타낸다.
둘째, 이 연구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은 탈시설 이후의 지원제도 체감도(가설 4), 사회자본(가설 5)에 각각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화 경험이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건강 상태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이 탈시설 이후의 지원제도 체감도를 매개로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가설 14), 마찬가지의 경로로 고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가설 15). 이는 탈시설 장애인의 과거 시설화 경험이 개인 심리적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심석순, 2010), 지원제도 체감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매개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탈시설 장애인은 퇴소 이후 국가의 지원제도를 주관적으로 체감할 때 과거의 시설화 경험을 토대로 인식하며, 현재의 제도 수준 자체와는 무관하게 이 경험은 지원제도를 체감할 때 부적 영향을 끼친다. 시설화 경험이 퇴소 이후 삶의 영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아 인식 및 정서적 안녕(이조경, 백순희, 2016), 사회적 적응과 관계 형성(강정희, 2018) 등에 관한 선행연구의 보고와 같다.
이 결과는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과 관계적 어려움들의 요인 중 하나로 시설화 경험이 조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의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박숙경 외, 2017), 이 연구를 통해 오히려 시설화 경험이 높을수록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이 낮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자립생활의 만족은 제도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나 사회적 연결망의 수준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열악한 환경, 강제된 관계, 규율된 생활방식으로부터의 탈피 또는 중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로 탈시설 이후 겪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을 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또는 하지 않아도 괜찮음)’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전근배, 2020).
시설 퇴소 이후에도 유지되는 시설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종종 보고되었다. 가령, 이상직(2019)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전 생애를 검토함으로써 ‘교육노동결혼출산은퇴’ 라는 흐름으로 구획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근대적 생애 과정과는 동떨어진 수용자들의 생애를 통해 ‘라이프 코스의 이중적 제도화’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Goffman의 총체적 시설을 공간적 측면이 아닌 시간적 측면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시설 수용이 수용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수용 기간에 한정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주은수(2022)도 상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장기적 누적 피해를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 수용기간 동안의 학대와 폭력 피해가 신체⋅정서⋅사회⋅경제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화의 경험을 갖고 탈시설 이후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삶을 꾸려간다는 점, 엄밀히 말하면 시설화의 역사를 내재화한 존재로서 자립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은 탈시설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는 사회자본(가설 7), 고립감(가설 8)에 각각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 체감도의 고립감에 대한 직접효과의 크기는 건강 상태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지원제도 체감도의 사회자본에 대한 직접효과의 크기도 건강 상태의 그것과 시설화 경험의 그것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원제도 체감도가 사회자본 및 고립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선행연구들의 경향과 같으며(고광영 외, 2016; 고명철, 2018), 그 영향의 정도가 개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상태 및 시설화 경험보다 크다는 점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사회적 건강의 유지에 주요한 변인임을 증명한다.
지원제도 체감도가 정책 집행의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1차 산출(output)보다는 2차 결과(outcome)와 관련이 있으며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효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정홍원 외, 2016), 탈시설 장애인이 인지하는 국가의 지원제도는 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하나의 분절된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인식‧규범의 총체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이 월 180시간의 활동 지원 급여를 책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생명’만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월 2명의 활동지원사를 배치받는다는 것은 그 2명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양적‧질적 발전 가능성이 조건 지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에 관련된 공식적 행위자들은 신변 처리,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현실의 활동지원사 개인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가를 통한 공식적‧인위적 행위에 개입하는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 A씨에게 오늘 활동지원사 1명이 오기까지 그 모든 공적 행위는 지원제도 체감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캐나다 ‘피플 퍼스트(People First)’의 공동 창립자였던 Patrick Worth가 시설을 두고 ‘그것은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National Task Force on Deinstitutionalization, 2023), 국가의 지원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과 사회자본 각각은 고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화 경험과 고립감이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은 시설의 구조와 관계로 나타나는 시설적 문화로 인한 순응, 무기력, 발달의 제약(박숙경 외, 2017)과 같은 시설화 경험이 탈시설 이후 고립감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석순(2010)은 시설 내 학대 피해 경험이 시설 퇴소 이후 사회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자존감과 장애 수용도를 매개하여 사회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행연구가 시설화 경험이 개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장애 수용도를 매개로 퇴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혔다면, 이 연구는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체감도라는 사회적 요인을 매개로도 탈시설 이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시설의 지지가 퇴소 이후 자립생활의 수준이나 레질리언스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강현아, 2010), 아동기 학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고립감을 예측한다(Başoğlu, 2019)는 등 아동 대상 연구들이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바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시설화를 바라보는 입장과 조작적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학대를 미시적 수준에서 피해-가해 구도의 경험으로 접근하는지 또는 거시적 수준의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예상된다. 실제로 동일한 표본을 활용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시설 내 학대 경험과 시설 퇴소 이후 사회참여 간에는 간접효과만 존재한다는 보고(심석순, 2010)와 직접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심석순 외, 2010)가 모두 존재하는데, 전자는 사회참여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측정한 ‘학대’, 자주성과 자율적 선택으로 측정한 ‘자기 결정력’,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방문자와의 관계로 측정한 ‘사회적 관계’를 모두 투입하였고, 후자는 ‘자기 결정력’과 ‘사회적 관계’를 제외한 ‘학대’ 개념만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시설화와 학대 또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별개의 개념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시설 거주 장애인 및 탈시설 장애인을 포괄하여 ‘시설 수용 생존자(survivors of institutionaliz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시키는 모든 형태의 시설로의 수용을 폭력‧인권침해‧차별로 해석하고 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 이를 감안한다면 시설화 경험을 특정 행위의 문제로 협소하게 조작적 정의할 경우에 시설화의 역사적‧제도적‧문화적 맥락과 그 효과의 복합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비록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조적 폭력을 승인하고 적절한 대안 모색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시설화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으로 반복될 수 있다.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과 고립감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사회자본과 고립감 간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 결과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에 대해 몇 가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선, 사회자본이 개인과 집단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효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의 처지에 있을 수 있다. 가령, 이 연구 참여자들의 최초 시설 입소 연령은 평균 15.7세이며 총 시설생활 기간이 평균 23.5년인데 반해 탈시설 기간은 평균 6.2년이라는 점, 그리하여 현재의 연령이 평균 45.4세라는 점은 탈시설 장애인이 처한 극단적인 사회자본 형성에서의 불평등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의 종속변인으로서 사회자본이 위치할 수는 있을지언정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회자본이 탈시설 장애인의 고립감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한 유의미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이 같은 결과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이 상당히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와 사회자본 간의 강한 관계, 즉 가설 7(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과 가설 14(시설화 경험 → 지원제도 체감도 → 사회자본)의 지지에서 알 수 있듯이,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국가의 제도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화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제도 체감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상징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소속된 멤버’로서의 자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일반적인 사회자본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공식적이거나 자연적인 지원만으로는 구축되기 어렵다(Parmenter, 2014).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회자본의 특징을 고려하면(Putnam, 1993),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제도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 수준을 높여 다른 자본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제도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대해 복지국가(제도)가 사회자본의 창출을 약화한다는 입장과 복지국가가 사회자본의 형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 모두 존재하지만(곽병훈, 2018), 이 연구 결과는 국가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건강 상태, 시설화 경험, 지원제도 체감도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하에 있으며, 그 자체로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통념을 반박하며, 시설화 경험이 국가 제도의 체감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경로를 밝힘으로써 기존 가정의 수정을 제안한다. 이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는 시설화 경험의 퇴소 이후 영향력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시설화 경험을 가급적 미리 예방하고, 탈시설 이후 시설화 경험이 유지‧연장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화 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소규모화와 같은 변형된 형태의 또는 소극적인 탈시설 정책은 시설 입소를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시설화 경험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소규모 시설로의 재배치를 통해 시설화 경험을 지속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시설화 예방 및 탈시설 이후 대책으로 제시되는 대안 역시 구조적‧관계적 시설화의 맥락에서 그 적절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설화 경험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성찰적 조치, 예를 들어, 시설 정책의 대상자가 된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피해 배상과 복구를 위한 국가적 지원, 시설화 경험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증언 및 공론화 과정이라는 사회적 캠페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제도 체감도가 중요한 독립변인이자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장애인 정책의 전 과정이 당사자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 연구의 정의에 따른 지원제도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험하면서 형성해 온 인지 도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자립생활 지원제도들이 지닌 효과성이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실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시설화 경험과 같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닌 사회적 맥락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당사자와 그의 옹호자가 제도의 수동적인 대상자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일정하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아 제도의 설계와 내용의 결정, 평가, 개선, 조정과 같은 정책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들이 지닌 효과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제도의 취지와 이용 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선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적지 않은 경우에 가족에 의해 비공식 지원과 대리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제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는 가족에 대한 개입과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시설화 경험과 장애 경험이 형식적 청취를 넘어 실질적으로 존중‧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 서비스 통제 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거나 당사자가 체득할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급여, 지원 인력, 지원받는 내용의 조정 등이 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지원과 옹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하며 획득하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국가의 제도적 지원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설계 시 주요한 평가 지점 중 하나가 제안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축적‧획득‧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역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이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현상이 초래되지는 않는가와 같은 지점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공간에서 낮 시간대의 전부를 보내며 지낸다면, 또는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센터‧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며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무한정 일종의 기술훈련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싶더라도 의료급여와 같은 중요한 공적 지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사회참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한다면, 결국 무엇도 시도할 수 없고 시도하지 못하게끔 강제됨으로써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명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제도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 또는 대체가 필요할 수 있다.
Notes
사회자본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 또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면(박희봉, 2016), 지원제도 체감도는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행위로서의 지원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경험에 기반하여 인식하는 주관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과 국가 또는 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자본이 정부 신뢰나 정책의 효과에 주는 순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행위 혹은 정책을 종속변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자본의 영향을 다룰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을 모호하게 처리하거나 몰역사성과 무맥락성으로 인해 적용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다(배유일, 2004).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구속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억압의 기제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익섭 외, 2007), Bourdieu의 관점에서 시설로의 배치는 자본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국가의 지원제도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만 어느 정도 기초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제도 체감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이 아니라 사회자본에 대한 지원제도 체감도의 영향에 대해 가정하였다.
이 연구는 오욱찬 외(2021)의 연구에 따라 현존하는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탈시설 상태 여부를 판단하였다. 시설 퇴소 후 현재 지원주거(지원주택)와 독립주거(본인 명의 주택) 유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행정적으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임시로 제공하는 중간단계 거주지인 전환주거(자립생활주택 등)에 있는 장애인을 탈시설 장애인으로 인정하였다.
References
. (2024. 2. 27).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해 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한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6269?tr_code=snews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prejudi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7(4), 263-273. [PubMed]
, , , , &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PubMed]
(2023. 8. 2). https://www.institutionwatch.ca/
, , , & (2011).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behavioral and biological health indicators in older adults. Health Psychology, 30(4), 377-385. [PubMed]
, , , & (2018).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25(13), 1387-1396.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9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4-16

- 682Download
- 611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