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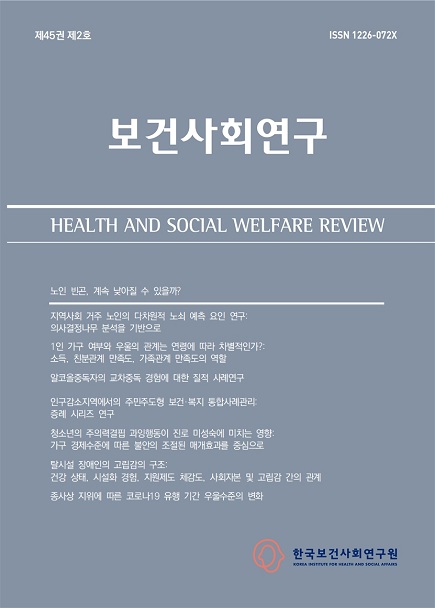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DPSS) 타당화 연구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K-DPSS)
Choi, Sun1; Park, Jeongsoo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468-493,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468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치매는 인지 능력 감퇴에 독립성 상실과 돌봄 부담을 동반하고, 아직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이로 인해 치매 관련 낙인은 질병 자체 외에도 환자, 가족, 일반 대중과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조기진단 및 개입을 방해한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모델에 기반하여 치매낙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공적낙인척도(DPS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20-69세 성인 1000명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DPSS)는 총 11문항, 4개 하위척도(‘불편/두려움’, ‘불능/상실’, ‘비인격화’, ‘부담’ )로 구성되었다. 치매태도 및 지식, 연령주의, 노인접촉 경험과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성별, 연령, 결혼 여부로 치매낙인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고, ‘부담’ 요인은 여성, 40~60대, 기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매낙인이 정서·인지·행동 측면에서 인구통계특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K-DPSS는 일반 대중의 치매낙인 현황을 파악하고, 낙인 완화 개입 및 정책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향후 7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집단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치매인식 개선의 심리사회적 개입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K-DPS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model, to systematically assess public stigma toward dementia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 total of 1,000 adults aged 20-69 completed an online survey.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n=300; n=700)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sults supported a four-factor structure comprising 11 items: discomfort/fear, incapability/loss, dehumanization, and burden. Behavioral stigma factor "exclusion", included in the original scale, was not retained in the Korean version. The K-DPSS demonstrated convergent validity through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ementia attitudes, fear of dementia, ageism, and anxiety about aging. Demographic analyses revealed that women, individuals aged 40-60, and married respon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burden subsca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igma-related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differ across demographic groups. The omission of the exclusion factor may reflect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a cultural tendency to suppress negative expressions. The K-DPSS is expected to serve as a validated instrument for evaluating psychosocial interventions aimed at promoting dementia awareness, informing caregiver support policies, and fostering dementia-friendly environments.
초록
본 연구는 사회인지모델에 기반하여 일반인의 치매낙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orean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K-DPSS)를 타당화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성인 20~69세 1000명을 두 집단(300명, 700명)으로 무선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 구조(불편/두려움, 불능/상실, 비인격화, 부담)를 확인했고, 원척도의 행동적 낙인요인 ‘배척’은 제외되었다. K-DPSS는 치매태도, 치매 두려움, 연령주의, 노화불안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여성, 40~60대, 기혼자 집단에서 ‘부담’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낙인의 정서적·인지적·행동적 구성요소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척’ 요인의 탈락은 사회적 바람직성 및 문화적 표현 억제 경향과 관련성이 시사된다. 본 척도는 치매인식 개선 교육, 가족 돌봄 정책,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문제 제기
2019년 기준 전 세계 치매 인구는 약 5,74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그 수가 약 1억 52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GBD 2019 Dementia Forecasting Collaborators, 2022).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치매 유병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1년 기준 60세 이상 7.24%, 65세 이상 10.33%이고 85세 이상에서는 38.96%로 나타난다(중앙치매센터, 2022). 또한, 전체 노인 인구 25%가량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증세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치매 고위험군의 확대가 우려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치매는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력,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감퇴하는 뇌 질환이다. 주요 위험요인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혈관성 치매, 전측두엽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도 유병률이 높다(Alzheimer's Association, 2024). 치매라는 진단은 기억 혹은 인지 능력 상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치매는 초기보다 중후반 단계로 갈수록 독립성과 자율성도 상실되어 일상생활 대부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족과 간병인이 감당할 정신적, 신체적 돌봄 부담이 상당하다(Zarit et al., 2019). 치매는 자신을 잃고,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며, 생애 후반의 불가역성과 통제불능성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전환을 상징하는 질환으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치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특정 연령대나 인지기능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널리 퍼져 잠재되어 있다(Kessler et al., 2012; Maxfield & Greenberg, 2020).
실제로 일반 대중의 거의 절반 정도는 치매의 인식과 태도, 고정관념이 부정적이고, 상당수 보건 의료 전문인력에도 유사한 양상이 보고된다(Herrmann et al., 2018; Piver et al., 2013). 치매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적 태도가 반영되는 치매낙인(dementia stigma)은 조기진단과 개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는 치매낙인 극복을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 과제로 정하였고(WHO, 2015; ADI, 2019), 국내 정책 역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치매낙인은 개인의 인식 수준을 넘어 사회문화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 위주의 기존 접근 방식만으로 낙인을 해소하기 어렵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낙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낙인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변화 추이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도구가 전제되어야 한다(Noguchi et al., 2022). 정량적인 평가 접근은 치매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적 반응, 태도를 구조화하고, 낙인 형성의 심리적 기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치매의 사회적 인식과 낙인 형성에는 ‘치매’라는 질병명이 지닌 언어적 함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치매(癡呆)는 ‘정신이상’을 뜻하는 라틴어 의학용어 ‘dementia’를 번역한 한자어로, 문자 그대로는 ‘어리석고 멍한 상태’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완화하고자, 2000년대부터 한자를 사용하는 대만, 일본, 홍콩과 중국은 치매 대신 각각 ‘실지증(2001)’, ‘인지증(2002)’, ‘뇌퇴화증(2012)’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해나, 2023). 한국은 보건복지부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 다수가 치매 용어가 주는 두려움과 편견, 거부감, 환자 비하의 느낌 등은 인정하면서도(43.8%), 치매 병명 개정에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크지 않게 보고되었다(변경 21.5%, 유지 27.7%, 상관 없음 45%; 보건복지부, 2021).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어도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Kim et al., 2023),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감정적 반응, 행동 양상의 근본적 변화 없이 병명 개정만으로 낙인 완화는 요원하다. 궁극적으로 치매낙인의 개선은 언어적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된 교육, 사회적 담론 변화, 구조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치매낙인의 실태와 인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치매낙인은 주로 태도나 인식의 하위 요소나 개념적 차원 정도로 다루어지고, 독립된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구조화된 척도로 측정하는 시도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치매낙인의 타당한 정량적 측정 도구의 도입은 정책수립 및 심리사회적 개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치매 공적낙인척도(Dementia Public Stigma Scale, DPSS; Kim et al., 2022)는 호주에서 일반인의 치매낙인 개선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되었다. DPSS는 사회인지모델에 기반하여 치매낙인을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다차원 구조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DPSS를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하여 국내 치매낙인의 심층적 논의를 도모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심리사회적 개입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치매낙인과 사회인지모델
낙인은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특정 방식의 속성, 행동, 평판”으로 정의되며,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Goffman, 1963). 정신질환이나 장애(disability)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불안, 두려움, 혐오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이러한 반응이 역설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회적 거리를 더 넓히고 낙인을 강화하게 된다(Wang, 1993). 이러한 점에서 Link와 Phelan(2001)은 사회적인 질병 낙인을 차별적 인식, 부적절한 사회적 속성 부여, 환자 ‘그들’과 ‘우리’ 구분, 사회적 지위 상실, 힘의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인지 모델은 낙인을 정해진 틀로 범주화하는 인지적 편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태도로 이해한다(Corrigan, 1998; Crocker & Lutsky, 1986). Corrigan과 Watson(2002)은 낙인의 구성개념을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제시하고, 인지적 귀인에서 출발하여 정서 반응과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치매 환자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초래하고, 치매환자를 피하는 행동과 함께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치매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은 개인 수준의 감정이나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태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반 대중이 쓰는 ‘노망’, ‘망령’과 같은 표현은, 치매 혹은 치매 환자를 폄하하는 공적낙인(public-stigma)의 대표적인 언어 표상에 해당한다(Baumgartner, 2017). 공적낙인은 환자 당사자에게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내면화되거나, 환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돌보는 조호자가 겪는 연계 낙인(courtesy stigma), 가족 낙인(family stigma)으로 확장되어, 치매 당사자를 비롯해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 2019).
치매에 대한 공적낙인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다(그림 1). 첫째, 치매의 조기진단과 치료, 사회적 지원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매낙인으로 사회적 배제와 수치심이 동반되어 증상을 숨기고, 전문적인 개입이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치료 개입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Cahill et al., 2008; Vernooij-Dassen et al., 2005). 둘째, 치매 진단을 받거나 예상될 경우, 자신이 무능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고, 결국 괴로움, 자존감 저하, 사회적 철회로 이어질 것이다(Nguyen & Li, 2020; Milne, 2010). 환자의 가족, 친구, 간병인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회적 배제와 고립(예: 뒤에서 이야기하거나 쳐다보는 행동)을 겪기도 한다(ADI, 2019). 셋째, 보건의료 전문가도 치매의 공적낙인을 체득하여 진단 자체를 회피하거나 치매 관련 서비스와 정보 전달을 보류한다는 보고도 있다. 정보의 불균형 및 의사결정의 배제는 조기의 도움 요청과 서비스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Gove et al., 2016; Werner & Heinik, 2008).
그림 1
치매낙인이 일반대중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Reducing the stigma associated with dementia: Approaches and goals”, Mukadam & Livingston, 2012, Aging Health, 8(4), 377-386.
최근 대규모 표본 조사(2907명)에서 치매 환자, 간병인, 일반 대중, 보건의료전문가 네 집단의 치매 관련 낙인을 직접 비교한 결과, 집단에 상관없이 다수가 낙인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Godoy et al., 2023). 전문가 약 3분의 1은 치매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므로, 환자에게 공식적, 명시적 진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대중 절반 이상이 치매 환자와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간병인의 32%는 치매 환자가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간병인과 보건의료전문가 30% 이상이 치매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정보 접근성 및 전문가 인식이 대중의 치매낙인 형성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시사한다.
타당하고 검증된 지식 및 근거 기반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치매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낙인 인식개선과 전문가 판단 역시 저해된다. 특히, 치매를 노화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환자에게 공식적 진단 제공에 소극적인 전문가의 태도는. 낙인에 기초한 일반인의 통념을 굳히는데 일조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의 낙인이 반영된 태도가 일반인과 간병인, 치매 환자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했다고 한다(Mukadam & Livingston, 2012). 반대로, 환자나 보호자를 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태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반 대중의 낙인 감소까지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ane et al., 2020). 이에 따라 Kane 외(2020)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존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교육적 개입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키우도록 제안하였다. 치매 관련 낙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Herrmann 외(2018)는 치매낙인 개선의 심리사회적 개입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치매낙인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치매낙인의 평가 도구
치매낙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자기낙인과 연계낙인보다 주로 공적낙인을 중심으로 사회인지 모델에 기반하여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구성개념을 정의하였다. 문항 내용의 구성은 노인이나 노화, 치매와 관련되거나 특정 질병(예. AIDS, 암)의 낙인을 평가하는 도구를 참고해서 이루어졌다(Nguyen & Li, 2020; Herrmann et al., 2018).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가족 낙인 척도(Family Stigma in Alzheimer's Disease Scale; FS-ADS)는 인지적 귀인(비호감, 위험), 정서적 귀인, 행동적 반응 등 낙인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양호~우수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Werner et al., 2011). FS-ADS 하위척도는 가족 낙인, 구조적 낙인, 일반인 낙인(lay persons’ stigma)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일반인 낙인 척도만 택하여 치매 공적낙인 연구에 이용되기도 한다(예. Johnson et al., 2015; Stites et al., 2018).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치매 공적낙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차 진료의 기억력 선별 검사 인식 척도(The Perceptions Regarding Investigational Screening for Memory in Primary Care: PRISM-PC; Boustani et al., 2008)는 ‘나는 치매에 걸리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와 같이 치매 진단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 하위척도에 낙인이 포함되어 있다(Werner, 2014). 호주의 Phillpson 외(2014)는 Fraboni 연령주의 척도(Fraboni Ageism Scale: FAS; Fraboni et al., 1990) 문항에서 노인을 치매 환자로 수정하고 (예. 나는 개인적으로 치매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치매에 관한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Alzheimer's Australia, 2010: ‘치매 환자는 대부분 매우 즐겁다’, ‘치매 환자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생활한다’)과 PRISM-PC 문항을 모두 아울러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치매낙인 평가 척도(Dementia stigma assessment scale)를 구성하였다. 해당 척도는 Phillpson 외(2014)가 중년 대상의 치매태도와 도움 추구 관계 연구에서 적용되었고, 최근 일본어로 번역되어 타당화 및 단축형 구성도 이루어졌다(Noguchi et al., 2022, 2023).
치매낙인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 검토(Herrmann et al., 2018; Nguyen & Li, 2020; Werner, 2014)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치매낙인 평가도구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즉, 합의된 기준(gold standard)이 비일관적이므로, 여러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가 어렵고, 구성 타당도 검증도 한계가 있다. 또한, 사전-사후 혹은 시간 경과에 따른 반복 측정이 가능한 도구 부족이 낙인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거나 근거기반의 낙인 감소 개입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장애물이라고 강조하였다(Herrmann et al., 2018). 정신질환 낙인의 평가도구와 비교해도 수가 적고, 치매의 개념적 틀에 맞는 낙인을 정의하고 개발한 척도 역시 소수에 불과하였다. 치매낙인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채 신념이나 정서적 반응만 측정한 연구도 있어(예. Werner, 2006; Werner & Giveon, 2008) 치매낙인을 평가한 결과는 신중한 해석이 권고되기도 한다(Nguyen & Li, 2020; Werner, 2014).
국내에서 치매낙인은 주로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 Scale, DAS; O'Connor & McFaden, 2010)로 측정되어 치매의 조기진단이나 치료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태도라는 개념으로 제시된다(장윤정, 2019). 2006년, 2012년, 2016년 국내 치매 역학조사에서 사용한 DAS는 치매태도를 다각도로 측정하면서 낙인을 다룬다(보건복지부, 2019). 그렇지만, DAS는 치매라는 질병과 환자를 향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중점으로 다루지 않고, 구조적 차별과 같은 낙인의 기본적 내용(Corrigan et al., 2000)도 포함되지 않았다(Kim et al., 2022). DAS 역시 FS-ADS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의 돌봄 부양자 대상으로 개발되어 통상적인 국민의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중앙치매센터, 명지병원, 2021). 한국어로 번안된 PRISM-PC는 하위척도에서 낙인을 측정하지만, 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김혜진, 정덕유, 2015), 이론에 근거하여 치매낙인을 독립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평가도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호주의 Kim 외(2022)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치매낙인의 인식 교육 및 심리사회적 개입과 함께 치매 공적낙인척도(Dementia Public-Stigma Scale, DPSS)를 개발하였다. DPSS는 낙인의 사회인지 모델에 근거하여 삼원모델(tripartite model of stigma; Corrigan, 2000)을 지지하는 고정관념(불능/상실, 비인격화), 편견(두려움/불편), 차별(부담, 배제)의 다면적 특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환자 당사자나 가족이 경험하는 낙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치매 관련 부정적인 인식, 신념, 태도를 평가한다고 명시하였다. 치매태도 관련 척도와 문헌을 토대로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서 척도 문항을 구성하고, 대규모 표본(성인 325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 검증을 통해 두려움/불편(fear/discomfort), 불능(incapability), 비인격화(personhood), 부담(burdern), 배제(exclusion)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치매 관련 낙인 연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호주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연구마다 동서양에 대한 비교문화적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국내에서 치매낙인 연구는 간호나 보건의료 중심으로 조기 치료의 동기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개념적 수준의 치매태도를 다룰 뿐, 조작적 정의와 정량적 측정 도구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Kim 외(2022)의 DPSS를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하여 치매태도의 포괄적인 개념을 치매낙인으로 구체화하고 직접 측정하여 다양한 연구와 교육, 심리사회적 개입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31-HB-02).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인바이트(Invight, Inc.)에 의뢰하여 만 20~69세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세대별, 성별 동등한 수로 표집되었다(각 세대 200명 중 남성 100명, 여성 100명).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고, 모든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는 즉시 개별적으로 1,500원 상당의 설문조사 기관 적립금을 보상으로 받았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전체 1000명을 300명과 700명으로 무선분할하였다. 먼저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배정된 300명 표본은 평균 연령 43.19세(SD=13.26)로 남성 160명(53.3%), 여성 140명(46.7%)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7명(12.3%), 전문대 졸업 43명(14.3%), 4년제 182명(60.7%), 대학원 졸업 이상 38명(12.7%)이었다. 혼인 상태는 비혼(미혼) 113명(37.7%), 기혼 171명(57.0%), 기타 16명(5.3%)이고, 직업은 사무직 109명(36.3%), 전문직 30명(10.0%), 무직 29명(9.7%), 관리직 22명(7.3%), 전업주부 22명(7.3%), 학생 19명(6.3%), 판매/서비스직 17명(5.7%), 자영업 15명(5.0%), 생산직 13명(4.3%), 영업직 6명(2.0%), 기타 18명(6.0%)이었다.
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선정된 표본 700명은 평균 연령 44.45(SD=13.64)세로, 남성 352명(50.3%), 여성 348명(49.7)이고, 최종 졸업이 중학교 이하 1명(0.1%), 고등학교 77명(11.0%), 전문대 104명(14.9%), 4년제 416명(59.4%), 대학원 석사 81명(11.6%), 대학원 박사 21명(3.0%)이었다. 혼인은 기혼 395명(56.4%), 비혼(미혼) 266명(38.0%), 기타 39명(5.6%), 직업은 사무직 260명(37.1%), 무직 76명(10.9%), 전문직 71명(10.1%), 전업주부 70명(10.0%), 관리직 41명(5.9%), 자영업 40명(5.7%), 학생 36명(5.1%), 판매/서비스직 29명(4.1%), 생산직 26명(3.7%), 경영직 12명(1.7%), 노무직 11명(1.6%), 영업직 8명(1.1%), 기타 20명(2.9%)이었다.
2. 조사 도구
치매 공적낙인은 일련의 인지, 정서, 행동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는 치매낙인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치매태도’, ‘치매인식’,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하위척도 혹은 개념적 설명으로 다루어졌으며, 구성 타당도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 모두 포함하였다. 연령주의 및 노인 경험은 치매와 상호교차하여 이중낙인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치매낙인과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리적 건강의 지표에 해당하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포함했고, 응답자 편향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도 추가하였다.
가. 치매 공적낙인 척도(Dementia Public Stigma Scale, DPSS)
Kim 외(2022)가 일반 대중의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해 개발하였다. 총 16문항이고, 7점 척도(0=전혀 아니다, 4=보통,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과 감정적 반응,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와 대중적 인식이 현저함을 뜻한다. Kim 외(2022) 연구에서 신뢰도가 양호하고(Cronbach’s α=.818), 구성 타당도 검증에서 두려움/불편(fear-discomfort), 불능/상실(incapability), 비인격화(personhood), 부담(burden), 배척(exclusion) 등 5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치매 공적낙인 척도의 한국어 번안 과정은 원 척도 개발자인 Kim이 직접 검토, 수정하고 최종 승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Kim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척도 사용과 번역 승인을 요청하였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가 유창한 원 저자는 한국어 번역본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을 원하였다. 임상심리학 교수 1인과 박사 과정생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종합하였다. 이메일로 한국어 번역본을 Kim에게 송부하였고, 원 저자가 직접 원래 문항의 의미가 일치하고, 문화적 맥락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문장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재수정한 후, 최종 한국어 번안 문항은 Kim의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번역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역번역 절차는 생략되었다.
나. 치매태도 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 DAS)
치매 환자의 돌봄 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O'Connor & McFaden, 2010). 국내 치매역학조사(2006년, 2012년, 2016년)를 비롯하여 간호사, 간병인, 돌봄 부양자,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중앙치매센터, 명지병원, 2022). 인지적 차원 및 정서, 행동적 영역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질병과 치매 환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해석된다. 원 척도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고, 본 연구도 같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다. 치매 두려움 척도(Korean version of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 K-FADS)
치매 예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French et al., 2012). 총 30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위영역은 일반적인 불안(General fear), 신체 증상(Physical symptoms), 파국적 태도(Catastrophic attitude)로 구성된다. 한국어로 번안된 K-FADS는 노인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하위영역 내적 합치도 .93~.95 범위였다(Mo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척도 총점의 내적 합치도 .95로 산출되었다.
라. 치매 지식 척도(Dementia Knowledge Scale, DK)
치매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지역주민에게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접근성 함양 및 교육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한 치매인식도1) 평가 도구이다(중앙치매센터, 명지병원, 2021). 치매 원인, 증상/진단, 치료/예방, 제도 등과 관련된 20개 문항에 응답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 ‘예/아니오’로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KR-20) .62로 측정되었다.
마. 연령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
Fraboni 외(1990)가 개발한 연령주의 척도는 29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로, 노인에 대한 적대적인 말, 회피, 차별을 평가한다. 김지연 외(2012)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고, 전체 척도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본 연구는 15문항 단축형으로 고정관념, 회피, 차별의 3요인 구조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김민수, 2024).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척도 총점 .87, 요인별 .70~.81 범위로 나타났다.
바. 한국판 단축형 주관적 안녕 지표(Korean Version of WHO Five Well-being Index, WHO-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5문항의 단축형 지표이다(Bech, 1999). 김현지 외(2010)가 지역사회 노인 우울과 삶의 질 평가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5: 항상 그렇다)에 답하고, 총점은 주관적 안녕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판 WHO-5(김현지 등, 2010)의 내적 합치도 .83이고, 본 연구에서 .88로 도출되었다.
사.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orean Short-Version of Social Desirability Scale, SDS-9)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 보고형 검사에서 응답자가 긍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답하는 편향을 말한다. Stöber(2001)가 개발한 SDS-17을 김용석 외(2008)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타당화하였고, 본 연구는 Rasch 모형으로 단축형을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배병훈 외, 2015). 총 9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내적 합치도는 Stöber(2001) 연구에서 .80이었고, 배병훈 외(2015)의 단축형은 .72였으며, 본 연구는 .62로 산출되었다.
아. 노인 접촉 경험 척도
Hutchison 외(2010)가 노인접촉척도를 기반으로 이한경(2016)이 선행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고, 4문항은 노인과의 접촉 빈도를 묻고, 6문항은 노인 접촉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4로 산출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무선 분할된 300명의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 인지 기술 통계분석과 문항 간 상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스크리 도표와 평행 분석, 최대우도법을 통한 모형 적합도 산출로 요인 수를 탐색하였다(김주환 외, 2009; 장승민, 2015).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을 적용하였다. 다른 700명 표본 대상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한 다음, 잠재변수의 개념 타당도, 집중(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구하였다. 개념 타당도의 적합성은 AVE 값 .50 이상, CR 값 .70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수렴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노화 및 치매 관련 척도와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K-DPSS 총점과 하위척도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K-DPSS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위배된 경우, 변량분석은 Welch의 F값을 제시하고, 사후검정은 Games-Howell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모든 사후검정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를 기준으로 하였다. t 검증에서 Cohen’s d 값으로 효과 크기를 계산하였고, 0.2 작은 효과, 0.5 중간 효과, 0.8 큰 효과로 해석하였다(Cohen, 1988).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AMOS 22.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전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검증하였다. 먼저 16개 문항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왜도와 첨도가 1미만으로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통계치 .805, Bartlett 구형성 지표(Bartlet’s Test of Sphericity) χ²=1652(df=120, p<.001)로 산출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난다. 요인 수 탐색을 위해 스크리 도표, 평행 분석,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스크리 도표와 평행 분석은 원 저자 Kim 외(2022)의 구인 타당도 결과와 동일하게 5요인을 지지하였다.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한 모형 적합도를 구하였다(김주환 외, 2009; 장승민, 2015)(표 1). RMSEA 값이 .08 이하는 허용가능하고, 05 이하일 경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적합도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Browne & Cudeck, 1992) 1~3요인은 적합도가 나쁘고, 4, 5요인은 허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
요인 수 탐색을 위한 모형 적합도 결과
| 요인모형 | χ² | df | p | RMSEA |
|---|---|---|---|---|
| 1요인모형 | 858.000 | 104 | < .001 | .155 |
| 2요인모형 | 435.000 | 89 | < .001 | .114 |
| 3요인모형 | 257.000 | 75 | < .001 | .090 |
| 4요인모형 | 165.000 | 62 | < .001 | .075 |
| 5요인모형 | 91.100 | 50 | < .001 | .052 |
| 6요인모형 | 33.600 | 39 | .714 | .000 |
4요인과 5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부하량 .30 미만의 문항은 삭제하고, 2개 이상 요인에서 교차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큰 요인으로 선정하여 주축 요인분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 차이가 .10이 안 되는 문항은 변별력 문제가 있어 삭제하였다(Safren, Truk, & Heimberg, 1997). 상술된 기준에 근거하여 4요인 모형은 5문항(‘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로 인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과 잘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활동에서 배제할 것이다’,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척할 것이다’)을 삭제한 2차 요인분석에서 모형 적합도가 좋아졌다. 반면, 5요인 모형은 1문항만 삭제하여도 요인 간 구조가 불안정하여 전체 모형이 수렴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배척(exclusion)’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구조가 일치하고, 모델의 통계적 안정성이 확보된 4요인 모형만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요인 문항의 총 11문항은 공통성(communality)이 적정한 수준(.258~.666)이고, 총 설명량은 54.70%로 1요인 2.037%, 2요인 1.887%, 3요인 1.256%, 4요인 0.836%이고(표 2), 원척도의 하위척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두려움/불편 1~3, 불능/상실 5~8, 부담 13, 14, 인간성 10, 11). 전체 내적 합치도는 양호한 수준이고(Cronbach α=.746) 1요인(.820)과 2요인(.800)도 양호하지만, 각각 2문항으로 구성된 3요인(.528)과 4요인(.709)은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문 항 | 1요인 | 2요인 | 3요인 | 4요인 |
|---|---|---|---|---|
| 6. 치매가 있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 .759 | .124 | -.017 | -.130 |
| 7. 치매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매우 비슷하다. | .682 | -.034 | .098 | -.074 |
| 5. 치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한다. | .669 | -.018 | .084 | .110 |
| 8.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660 | -.075 | -.020 | .233 |
| 2.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닿아도 불편하지 않다.(-) | -.057 | .843 | .005 | .124 |
| 3.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 | .115 | .790 | .014 | .003 |
| 1.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 | -.034 | .715 | -.002 | -.155 |
| 13.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 .080 | .009 | .815 | -.078 |
| 14. 치매가 있는 사람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 | -.078 | .007 | .695 | .127 |
| 11. 치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한지 알 수 있다. (-) | .030 | .067 | -.075 | .619 |
| 10. 치매가 있는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있다. (-) | .043 | .046 | .135 | .536 |
| 초기 고윳값 | 2.781 | 1.140 | .481 | .346 |
| 설명량 | 2.037 | 1.887 | 1.256 | .836 |
| 신뢰도 (Cronbach α) | .820 | .800 | .528 | .709 |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도구의 교차검증을 위하여 무선 분할된 700명 표본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조하여 오차 상관을 추가하였다. 4요인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146.454(df=36, p<.001), CFI .950, TLI .923, RMSEA .066(.055~.078), AGFI .933으로 수용가능한 모형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SRMR .081로 근소하게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CFI, TLI≥.90, RMSEA, SRMR≤.08; 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5~.86으로 모든 문항이 .50 이상 기준을 상회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1.96이상(p<.01) 기준에 충분하였다. K-DPSS의 치매 공적낙인이 불능, 불편/두려움, 부담, 비인격화로 구성된 4요인 모델의 양호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K-DPSS 신뢰도 분석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전체 문항 .76이고, 불능 .76, 불편/두려움 .82로 적정 수준인 반면, 부담 .64, 비인격화 .62로 상대적으로 신뢰도 수준이 낮은데, 적은 문항 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 모형 | χ²(df) | CFI | TLI | RESEA | SRMR | AGFI |
|---|---|---|---|---|---|---|
| 4요인 모형 | 146.454(36)* | .950 | .923 | .066 (.055~.078) | .081 | .933 |
3. 개념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개념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알 수 있는 다중상관제곱(SMC) 값은 3문항(7번, 8번, 14번)을 제외한 8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였다(SMC≥.40). 표준화 요인적재량(.58~.86)은 .50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였지만, 평균분산추출(AVE) 값(.29~.61) 및 개념 신뢰도(CR) 값(.45~.82)은 일부 기준에 못 미쳤다(AVE≥.40, CR≥.70). 즉, 요인별로 각 측정문항은 불능, 불편, 부담, 인간성 등 잠재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및 개념 타당도 검증 결과
| 요인 | 문항 | B | β | S.E. | z | SMC | CR | AVE |
|---|---|---|---|---|---|---|---|---|
| 불능 | 6. 치매가 있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 1.00 | 0.74 | 0.54 | 0.76 | 0.44 | ||
| 7. 치매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매우 비슷하다. | 0.80 | 0.55 | 0.06 | 0.80 *** | 0.31 | |||
| 8.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0.95 | 0.61 | 0.07 | 0.95 *** | 0.37 | |||
| 5. 치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한다. | 1.04 | 0.75 | 0.07 | 1.04 *** | 0.56 | |||
| 불편/ 두려움 | 1.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 | 0.88 | 0.70 | 0.05 | 0.88 *** | 0.48 | 0.82 | 0.61 |
| 2.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닿아도 불편하지 않다.(-) | 0.95 | 0.82 | 0.05 | 0.95 *** | 0.67 | |||
| 3.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 | 1.00 | 0.82 | 0.67 | |||||
| 부담 | 13.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 1.25 | 0.86 | 0.14 | 1.25 *** | 0.74 | 0.52 | 0.36 |
| 14. 치매가 있는 사람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 | 1.00 | 0.58 | 0.34 | |||||
| 비인격 | 10. 치매가 있는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있다. (-) | 1.00 | 0.64 | 0.41 | 0.45 | 0.29 | ||
| 11. 치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한지 알 수 있다.(-) | 1.00 | 0.67 | 0.45 |
판별 타당도는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과 AVE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표 5). 요인 간 상관계수는 .22~.54 범위였고, 상관계수의 제곱을 구한 값(.08~.29)이 모두 AVE 값보다 모두 적어 판별 타당도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5
판별 타당도 결과
| 불능 | 부담 | 불편/두려움 | 비인격화 | AVE | CR | |
|---|---|---|---|---|---|---|
| 불능 | 1 | 0.75 | 0.76 | |||
| 부담 | 0.54 (0.29)*** | 1 | 0.72 | 0.52 | ||
| 불편/두려움 | 0.29 (0.08)*** | 0.29 (0.08)*** | 1 | 0.84 | 0.82 | |
| 비인격화 | 0.32 (0.10)*** | 0.22 (0.05)*** | 0.38 (0.15)*** | 1 | 0.71 | 0.45 |
4. 수렴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 분석 결과
K-DPSS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노화 및 치매 관련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 연령은 K-DPSS 총점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척도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연령은 ‘불편/두려움’과 부적 상관(r=−.14 p<.001), ‘불능’(r=.12, p<.01) 및 ‘부담’(r=.22, p<.001)은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낙인의 두려움과 불편은 줄어들지만, 치매로 인해 능력이나 인간다움의 상실, 돌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치매태도를 측정하는 DAS와 K-DPSS 총점, 하위척도 모두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특히 K-DPSS 총점은 r=−.63(p< .001)로 강한 부적 관계성을 보였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낙인이 저하된다는 의미로, K-DPSS의 수렴 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K-FADS와 K-DPSS 총점이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r=.20, p<.001), ‘불편/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 역시 유의하였다. K-FADS가 측정하는 치매 두려움과 K-DPSS 하위척도 ‘불편/두려움’은 명칭은 유사해도 서로 다른 ‘두려움’을 측정한다고 해석된다. 치매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DK 역시 K-FADS와 마찬가지로, K-DPSS 총점(r=.16, p<.001), 불능(r=.14, p<.001), 비인격화(r=.14, p<.001), 부담(r=.18, p<.001)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지만, 불편/두려움 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연령주의(FSA)는 K-DPSS 총점과 ‘불편/두려움’ 요인 이외의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총점 r=.20, p<.01), 불능 r=.15, p<.01), 비인격화(r=.21, p<.01), 부담(r=.16, p<.01). 노화불안을 측정하는 AAS도 K-DPSS 총점, 하위척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불편/두려움 r=.32, p<.001, 불능 r=.15, p<.001, 비인격화 r=.13, p<.001, 부담 r=.24, p<.001).
표 6
K-DPSS와 노화 및 치매 관련 척도 상관분석 결과
| 치매낙인 총점 | 요인1: 불편/두려움 | 요인2: 불능 | 요인3: 비인격화 | 요인4: 부담 | |
|---|---|---|---|---|---|
| 연령 | .07 | -.14*** | .12** | .08* | .22*** |
| 치매 긍정적 태도(DAS) | -.63*** | -.65*** | -.25*** | -.43*** | -.27*** |
| 치매 두려움(FADS) | .20*** | -.02 | .25*** | .15*** | .19*** |
| 치매 지식(DK) | .16*** | -.01 | .14*** | .14*** | .18*** |
| 연령주의(FSA) | .20** | .05 | .15** | .21** | .16** |
| 노화 불안(AA) | .33*** | .32*** | .15*** | .13*** | .24*** |
| 노인 접촉 경험(OC) | -.32*** | -.42*** | -.07 | -.17*** | -.12** |
| 주관적 안녕(WBI) | -.17*** | -.27*** | .00 | -.11** | -.02 |
| 사회적 바람직성(SDS) | -.03 | -.10** | .03 | -.05 | .07 |
노인 접촉 경험(OC)은 K-DPSS에서 ‘불능’을 제외한 총점과 다른 하위척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총점 r=−.32, p<.001, 불편/두려움 r=−.42, p<.001, 비인격화 r=−.17, p<.001, 부담 r=−.12, p<.01).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SDS-9)는 K-DPSS ‘불편/두려움’ 요인만 유의미한 부적 관계(r=−.10, p<.01)가 확인된다. 주관적 안녕 지수(WBI)와 K-DPSS 총점과 하위척도 ‘불편/두려움’이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총점 r=−.17, p<.001, 불편/두려움 r=−.27, p<.001).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제시 경향과 주관적인 삶의 만족이 클수록, 치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편견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인 접촉 경험이 치매낙인을 예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DPSS는 치매 및 노화 인식과 태도를 잘 반영하고, 사회적 바람직성, 웰빙과 구분되는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치매 관심 및 치매 대비 계획 여부에 따라 K-DPSS 점수가 다른지 t 검증을 하였다. 치매 관심은 K-DPSS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치매에 대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낙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고, 효과 크기도 중간 수준에 근접하였다(t=3.41, p<.001, d=.44).
표 7
치매 관심 및 대비 계획 유무에 따른 K-DPSS 점수 평균(표준편차) 비교
| 있음 M(SD) | 없음 M(SD) | t | d 1) | |
|---|---|---|---|---|
| 치매 관심 | 51.03(7.34) n=422 | 52.01(8.37) n=278 | 1.64n.s | 0.12 |
| 치매 계획 | 48.49(7.20) n=72 | 51.76(7.77) n=628 | 3.41*** | 0.44 |
1) Cohen’s d: 0.2 작은 효과, 0.5 중간 효과, 0.8 큰 효과(Cohen, 1988)
5. K-DPSS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관계
K-DPSS 총점과 하위척도는 성차가 없었으나, 하위척도 ‘부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컸다[남성 M=10.19(SD=2.14), 여성 M=10.57(SD=2.19), F(1, 698)=5.43, p<.05].
연령을 세대별로 범주화하여 비교한 결과, K-DPSS 총점 및 하위척도 ‘비인격화’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척도 ‘불편/두려움’(F(4, 695)=7.81, p<.001), ‘불능’ [F(4, 695)=2.75, p<.05], ‘부담’ [F(4, 695)=7.76, p<.001]에서 각각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였다. 사후 검증에서 ‘불편/두려움’은 30-40대와 50-60대, 불능과 부담은 20대와 중장년 세대와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전 연령대에서 치매낙인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대에 따라 치매낙인의 세부 내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표 8
성별 및 세대별 K-DPSS 점수 평균(표준편차) 비교
| 남(n=352) | 여(n=348) | Fw 1) | |
|---|---|---|---|
| 치매낙인 총점 | 51.04(7.35) | 51.81(8.17) | 1.744 |
| 불편/두려움 | 12.96(3.60) | 13.12(3.82) | 0.339 |
| 불능 | 20.26(3.50) | 20.64(3.67) | 1.954 |
| 비인격화 | 7.64(2.25) | 7.49(2.42) | 0.702 |
| 부담 | 10.19(2.14) | 10.57(2.19) | 5.426* |
K-DPSS 총점은 학력, 거주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결혼과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비혼인 경우, 기혼보다 K-DPSS 총점과 하위척도 ‘불능’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적고, 하위척도 ‘부담’은 기혼과 기타(사별, 이혼 등)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K-DPSS 총점 평균: 기혼 52.07(SD=7.49), 비혼 50.54(SD=8.17), 기타 50.92(SD=7.37)]. 직업은 전업주부와 사무직에서 점수 차이가 있었으나 근소하게 유의하지 않았다[전업주부 n=70, M=54.37(SD=7.29), 사무직 n=260, M=50.72(SD=7.21), Fw(13, 42, 41)=1.91, p=.057].
표 9
세대별 K-DPSS 총점 및 하위척도 점수 평균(표준편차) 비교
| 20대(n=140) | 30대(n=143) | 40대(n=139) | 50대(n=139) | 60대(n=139) | Fw | Post-Hoc | |
|---|---|---|---|---|---|---|---|
| 치매낙인 총점 | 50.02(7.65) | 51.58(8.26) | 52.13(8.61) | 51.55(7.59) | 51.83(6.52) | 1.56 | |
| 불편/두려움 | 13.11(3.83) | 13.83(3.81) | 13.88(3.53) | 12.21(3.57) | 12.13(3.44) | 7.81*** | [30, 40 > 50, 60] |
| 불능 | 19.76(3.61) | 20.29(3.73) | 20.34(3.89) | 20.96(3.32) | 20.88(3.28) | 2.75* | [20<50] |
| 비인격화 | 7.53(2.37) | 7.24(2.17) | 7.53(2.47) | 7.63(2.48) | 7.91(2.14) | 1.73 | |
| 부담 | 9.61(2.26) | 10.22(2.09) | 10.38(2.12) | 10.76(2.20) | 10.91(1.97) | 7.76*** | [20<40, 50, 60] |
Ⅴ. 결론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치매의 조기선별과 예방, 전문적 도움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일반 대중의 인식개선 및 낙인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치매낙인 감소 개입을 위해 Kim 외(2022)가 개발한 치매 공적낙인 척도(Dementia Public Stigma Scale, 이하 DPS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해 한국의 일반적인 치매낙인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DPSS는 공적낙인의 정서적 반응(‘불편/두려움’) 및 인지적 귀인(‘불능/상실’, ‘비인격화’)으로 4 요인구조 11문항은 원척도와 동일하다. 4요인 모델의 K-DPSS도 치매 공적낙인을 정량적으로 판별하여 정의하고, 적합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확인되었다. 일반 대중에게 치매가 있는 노인은 인간다운 독립성과 존엄성을 잃는 ‘비인격화(요인 3)’로 삶의 질이 낮고, 가족과 사회의 ‘부담(요인4)’이자, ‘불능/상실(요인2)’의 고정관념이 일반화되어 치매라는 질병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두려움(요인1)’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질병 낙인이 형성되어 있다. 언론과 방송에서 반복해서 재현되는 치매 환자의 의존적 모습이나 치매 말기의 삶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회피 정서를 강화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은 인지적 정보보다 정서적 이미지를 더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다. K-DPSS는 이처럼 치매와 환자 자체에 대한 일련의 인지적 귀인과 신념, 정서적,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반응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방향은 치매 예방과 조기개입을 지향하지만, 낙인은 일반 대중의 도움-추구 그리고 의료보건전문가의 조기진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Mukadam & Livingston, 2012; 그림 1). 치매낙인의 개선은 사전에 치매 조기선별과 전문상담 서비스 접근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치매 진단이 지연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K-DPSS는 이러한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시사된다.
K-DPSS의 치매 공적낙인 점수는 상관분석에서 부정적인 치매태도(DAS), 치매 두려움(K-FADS) 연령주의, 노화불안(AAS)이 클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노인접촉 경험(OC)과 치매 지식(DK)이 많을수록 치매낙인은 감소하고, 치매낙인 감소는 주관적 안녕지수(WBI) 증가와 관련성이 나타났다. 미래 치매 발병을 대비한 계획이 있을 때, 낮은 치매낙인 점수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치매 대비 계획과 같은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의지가 치매낙인 개선과 연결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청년 대상 연구에서 과거 노인과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불편함과 부정적 태도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ousfield & Hutchison, 2010). 접촉 경험이 노인이나 정신질환, 치매의 부정적 인식, 낙인, 사회적 외면을 예방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치매태도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접촉의 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Angermey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불편/두려움’은 30-40대가 50-60대보다 더 크고, 치매 환자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여기는 ‘부담’은 20-30대보다 50-60대가 상대적으로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30-40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노화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 50-60대의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 심리적·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조호자 역할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치매와 노화를 실제적이고 가까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오은아, 2020). 이에 치매낙인 감소의 개입을 위해서는 세대별 차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K-DPSS 총점은 성별, 세대별, 결혼, 직업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공적 치매낙인은 결혼과 직업에서 차이가 있고, 하위차원 ‘부담’은 성별, 세대별, 결혼 여부에서 점수가 달랐다. 특히 여성, 40-60대, 기혼자인 경우, ‘부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점에서 이들이 치매의 돌봄 책임과 역할에 관한 부담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조호자 731명 대상의 조사 결과(김영범 외, 2024), 조호자들의 평균 연령은 57.27세, 여성이 67.2%를 차지했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33.7%, 아들 내외 35.8%, 딸내외 27.7%이었는데, 자녀보다 배우자가 조호자인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자녀와 달리 배우자는 돌봄 역할의 큰 변화가 없고, 사회문화적으로 기대하는 조호 기간과 형태가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치매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고, 치매낙인의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부담’ 요인은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와 가족 중심 돌봄의 구조적 낙인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처럼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제안할 수 있다.
‘불편/두려움(요인1)’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바람직성(SDS-9) 점수와 의미 있는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타인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수록 치매라는 질병이 불편한 감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원 척도에서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활동에서 배제할 것이다.’,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척할 것이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된 ‘배척’ 요인이 K-DPSS에 누락된 점도 단순히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과 한국 사회에서 해당 항목들이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비되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도 서양보다 동양 국가와 민족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Dudley et al., 2005; Keilor et al., 2001). 노인을 공경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한국 유교 문화의 영향 하에서(Luo et al., 2013), 노인이나 치매와 관련된 행동적 차별 표현은 자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거부와 회피가 분명한 ‘배제’, ‘못 본 척’ 문항에 솔직한 반응을 주저한 채 보수적, 방어적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원 척도의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불편/두려움 요인)’,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로 인해 더 이상 자기자신이 아니다(비인격화 요인)’ 문항이 K-DPSS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 노인 혹은 치매와 관련된 구조적인 차별이나 적대적 감정과 행동은 반응 회피나 왜곡으로 자기보고형 척도로 평가되기 어렵고, 관련된 척도 개발에서도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양 그리고 한국 문화권 반응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낙인의 ‘행동적 반응’은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구성이 필요하겠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세대별, 성별 비율로 비교적 많은 인원(1000명)의 표본을 구성하였지만, 온라인 설문업체의 패널 특성으로 특정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편중되었다. 전체 표본 중 대졸 이상이 73.8%(4년제 졸업: 598명, 59.8%, 대학원 이상 140명, 14.0%)로 학력 수준이 높고, 직업도 사무직 비중이 36.9%로 컸으며, 기혼자가 56.6% 절반 이상으로 특정 사회, 경제적 특성 집단이 과표집되었다. 학력이 낮은 집단의 치매낙인 수준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어 K-DPSS 결과의 일반화는 제한이 따른다. 선행 연구에서 치매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고학력자가 치매 환자에게 비교적 호의적이고(Cheng et al., 2011), 교육 기간이 짧을수록 치매 공적낙인의 가능성이 2.32배 증가한다는(Blay & Peluso, 2010) 보고를 감안해서 후속 연구는 저학력 집단과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치매인식개선 및 정보 전달 전략에서도 이들을 우선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설문이 온라인으로 시행되어 70대와 80대 고령층이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9,938명으로 전체 19.2%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30년 25.3%, 2050년 40.1%, 2072년 47.7%까지 증가가 전망된다(통계청, 2024). 인구 구조의 변화 추세로 인해 75세 이상이 본격적인 노령층으로 분류되고, 실제 인지기능 저하, 치매 진단, 치매 가족 간병 등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즉, 70대는 공적낙인을 내면화하여 자기낙인 혹은 연계낙인으로 전환되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현실에서 직접 겪을 수 있다. 유독 75세 이상에서 치매낙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Piver et al., 2013) 역시 낙인 양상과 경험에서 다른 연령대와 분명한 차별점을 시사한다. 향후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의 공적낙인, 자기낙인, 연계낙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80대 이상 후기 노년기까지 표집하여 연령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치매낙인 극복, 조기개입, 치매 가족 지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표 중 SRMR이 .081로 기준치(.08)를 미세하게 초과한 점, 4요인 중 ‘부담’과 ‘비인격화’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개념 타당도에서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점 등이 발견되어 K-DPSS 개념 측정의 정교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문항 추가 및 보완이 제안된다. 특히 ‘배척’과 같이 행동적 낙인 반응의 문항들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제외된 점 역시 방법의 한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배척, 차별, 소외와 같이 치매낙인의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한 낙인이나 고정관념은 자기보고형 설문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상충되는 결과로 인해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Moyle et al., 2011; Werner & Davidson, 200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묵적 관계 평가 절차(Implicit Relational Assessment Procedure: IRAP; Kane et al., 2020)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긍정적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노인과 치매 관련 부정적 고정관념을 외면하거나 솔직한 표현을 자제하도록 영향을 미쳐서 자기보고형 방식의 응답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노인은 온정적이지만 무능하다는 고정관념(Cuddy et al., 2005)과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연령주의는 범문화적 현상이며(김지연 외, 2012), 인지기능 저하가 특정되는 치매 노인을 향한 연민과 거리감은 더욱 커지기도 한다(Caskie et al., 2024). 향후 치매 공적낙인 평가는 이와 같은 양가적 연령주의와 질병 낙인의 관계를 고려하고, 복합적인 정서 및 행동 반응 양상을 탐색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문화적인 규범과 정서 표현 양식,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이 낙인 형성과 측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치매낙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K-DPSS는 사회인지모델에 근거하여 낙인의 인지, 정서, 행동 구성개념을 명확히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도록 구조화하였으며, 엄정한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평가 도구이다. 치매 환자를 '비인격화', '불능', '부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 구조와 함께, 환자와 질병 자체에 대한 '불편/두려움' 정서가 관계를 명시하는 유용성도 갖추었다. Mukadam과 Livingston(2012)은 낙인 감소는 개인과 사회 양방향에서 접근하도록 제안한다(그림 3). 개인 수준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접근, 전인적 관점, 문제해결 및 임파워먼트 등이 필요하고, 사회 수준은 진단명의 낙인, 제도적 개선, 지역사회 돌봄과 같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치매와 낙인 교육 및 사회적 접촉 장려는 개인-사회 수준 모두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조한다. K-DPSS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 개입 전후의 낙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실용적 도구로,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 연계 프로그램, 간병인 및 보건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다. K-DPSS가 치매 조기선별과 예방을 위한 공공정책 및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3
개인과 사회의 치매낙인 개선을 위한 제안
출처: “Reducing the stigma associated with dementia: Approaches and goals”, Mukadam & Livingston, 2012, Aging Health, 8(4), 377-386.
References
. (2021).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
. (2023). 치매 용어 개정을 통한 인식개선 논의 시작: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
. (2022).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https://ansim.nid.or.kr/community/pds_view.aspx?bid=243
. (2023. 1. 18). '치매' 명칭 바꾼다... 정부, 개정 작업 본격 착수. 헬스조선.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3011801561
. (2019).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 https://ansim.nid.or.kr/community/pds_view.aspx?bid=209
. (2021). 치매 오늘은.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1.aspx#a
. (2022). 대한민국 치매현황. https://ansim.nid.or.kr/community/pds_view.aspx?bid=243
. (2024. 3. 26). 2023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0089
(2024). 10 warning signs of Alzheimer’s disease. https://www.alz.org/media/Documents/alzheimers-dementia-memory-loss-alzheimers-10-warning-signs-b.pdf
(2019). World Alzheimer Report 2019: Attitudes to dementia. https://www.alzint.org/u/WorldAlzheimerReport2019.pdf
, , , , & (2009). The public’s perceptions about cognitive health and Alzheimer’s disease among the U.S. population: A national review. The Gerontologist, 49(S1), S3-S11. [PubMed]
, , & (2004).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and social distance from people with schizophrenia and major depression: Testing a model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population survey. Schizophrenia Research, 69(2-3), 175-182. [PubMed]
(1999).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ments in the assessment of pain clinic results. Acta Anaesthesiologica Scandinavica, 43(9), 893-896. [PubMed]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PubMed]
, & (2010). Public stigma: The community's tolerance of Alzheimer diseas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2), 163-171. [PubMed]
, , , , , & (2008). The attitudes and practices of general practitioners regarding dementia diagnosis i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7), 663-669. [PubMed]
, , & (2024). Effects of Alzheimer’s diagnosis and gender on ageist attitudes, aging anxiety, and emotional reactions to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64(4). [PubMed]
, , , , , , , & (2011). The effects of exposure to scenarios about dementia on stigma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care in a Chinese communit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3(9), 1433-1441. [PubMed]
(1946). Response sets and tes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Bulletin, 52, 281-302. [PubMed]
, , , , & (2005). Racial differences i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in selection contexts: Magnitud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5(1), 50-64. [PubMed]
, , , & (2012). The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 A new measure designed to assess anticipatory dementia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7(5), 521-528. [PubMed]
, , , , , , & (2018). A systematic review of dementia-related stigma research: Can we move the stigma dial?.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6(3), 316-331. [PubMed]
, , , , & (201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disease label and disease prognosis to Alzheimer's stigma: A vignette-based experi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143, 117-127. [PubMed]
, , & (2020). Assessing implicit and explicit dementia stigma in young adults and care-workers. Dementia, 19(5), 1692-1711. [PubMed]
, , , , & (202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7(2). Article e5672 [PubMed]
, , & (2007). Making sense of dementia in the social world: A qualitative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4(4), 989-1000. [PubMed]
, , & (2008). Cultur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925. [PubMed]
(2010). The ‘D’ word: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discrimination and dementia. Journal of Mental Health, 19(3), 227-233. [PubMed]
, , , & (2011). Care staff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working with older people with dementia.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30(4), 186-190. [PubMed]
, & (2020). Understanding public-stigma and self-stigma in the context of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of the global literature. Dementia, 19(2), 148-181. [PubMed]
, , , , , & (2023). Development of a Short Version of the Dementia Stigma Assessment Scale.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5(6-7), 456-458. [PubMed]
, & (2010).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Dementia Attitude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2010, 1-10. [PMC]
, , , & (2014). Correlates of dementia attitudes in a sample of middle-aged Australian adults.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33(3), 158-163. [PubMed]
, , , , , , & (2013). Describing perceived stigma against Alzheimer's disease in a general population in France: The stigm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8(9), 933-938. [PubMed]
, , , & (2017). The relation between mastery, anticipated stigma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a primary care setting.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5, 801-804. [PubMed]
, , & (1997). Factor structure of social fears: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3), 253-270. [PubMed]
, , , & (2007). Stigma: Ignorance, prejudice or discriminat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0(3), 192-193. [PubMed]
, & (2017). Cultures differ in the ability to enhance affective neural responses. Social Neuroscience, 12(5), 594-603. [PubMed]
, , , , , , & (2005). Factors affecting timely recognition and diagnosis of dementia across Europe: From awareness to stigm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4), 377-384. [PubMed]
(2006). Lay perceptions regarding the competence of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7), 674-680. [PubMed]
, & (2004). Emotional reactions of lay persons to someone with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9, 391-397. [PubMed]
, & (2008). Discriminatory behavior of family physicians toward individuals with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0(4), 848-859. [PubMed]
, & (2008). Stigma by association and Alzheimer's disease. Aging and Mental Health, 12(1), 92-99. [PubMed]
, , & (2010). Subjective experience of family stigma as reported by children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2), 159-169. [PubMed]
, , & (2011).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Family Stigma in Alzheimer’s Disease Scale (FS-ADS). Alzheimer Disease & Associated Disorders, 25(1), 42-48. [PubMed]
(2015). First WHO ministerial conference on global action against dementia: Meeting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first-who-ministerial-conference-on-global-action-against-dementia
, , , , & (2019). Family support and caregiving in middle and late life. In B. H. Fiese, M. Celano, K. Deater-Deckard, E. N. Jouriles, & M. A. Whisman (Eds.), APA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y psychology: Applications and broad impact of family psychology (pp. 103-11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pendices
부록.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DPSS)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 번호 | 문항 | 전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 ||||
|---|---|---|---|---|---|---|---|---|
| 1 |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 (-) | 1 | 2 | 3 | 4 | 5 | 6 | 7 |
| 2 | 치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한다. | 1 | 2 | 3 | 4 | 5 | 6 | 7 |
| 3 | 치매가 있는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 4 |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 1 | 2 | 3 | 4 | 5 | 6 | 7 |
| 5 |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닿아도 불편하지 않다. (-) | 1 | 2 | 3 | 4 | 5 | 6 | 7 |
| 6 | 치매가 있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 1 | 2 | 3 | 4 | 5 | 6 | 7 |
| 7 | 치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한지 알 수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 8 | 치매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매우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6 | 7 |
| 9 | 치매가 있는 사람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 | 1 | 2 | 3 | 4 | 5 | 6 | 7 |
| 10 | 치매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 1 | 2 | 3 | 4 | 5 | 6 | 7 |
| 11 | 나는 치매가 있는 사람과 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5-10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20

- 1475Download
- 355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