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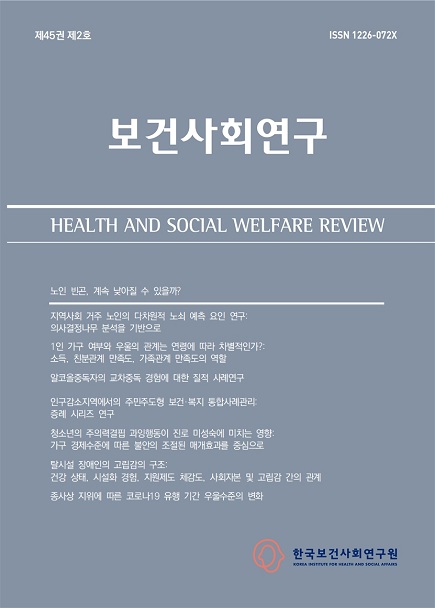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에 관한 연구: 사용자 및 공급자 경험
Musculoskeletal Discharge Coordination Service: User and Provider Experience
Kwag, Eunyoung1*; Chae, Hana1; Kim, Minji1; Hong, Eunsol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494-516,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494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퇴원 이후 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연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만성 통증과 이동 제한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며, 지속적인 돌봄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현재 서비스는 주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을 통해 퇴원연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이용자와 제공자 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 입원 초기 개입과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 제공자 역량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차이, 퇴원 후 자가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이 핵심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정보 전달의 부족과 서비스 수용성 저하,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 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효과적인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입원 초기 다학제 협력,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표준화된 실무지침과 지역 자원 정비,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단일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적· 질환적 한계가 있어 향후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를 시행 중인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the ‘Experiences of Users and Providers of Musculoskeletal Discharge Linkage Service’, a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stablish a public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syste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users and providers of the musculoskeletal discharge linkage service at Seonam Hospital in Seoul, conducted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14, 2024.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sers, 11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Factors hindering the use of discharge linkage service’, ‘Satisfactory discharge linkage service’, and ‘Most necessary resources for discharge to home.’ From the experiences of the providers, 10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Factors hindering return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Factors for success in discharge linkage service’, and ‘Support system for successful return to the commun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discharge linkage services, incorporating the multifaceted perspectives of both users and providers. Notably, it highlights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n topics such as the need for discharge-linked services,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during hospitalization, the need for standardized practices for multidisciplinary cooperation, and strategies for enhan cing self-management capabiliti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through linkages between hospitals and local communities. The results can therefore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discharge-linked services and for establishing business models for responsible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초록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인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경험에서 하위범주 11개, 범주 3개가 도출되었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방해요인’, ‘만족스러운 퇴원연계서비스’,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도출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경험에서 하위범주 10개, 범주 3개가 도출되었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방해요소’, ‘퇴원연계서비스 성공요소’, ‘성공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지체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퇴원연계서비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를 통해 드러난 퇴원연계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및 제공자 간 인식의 차이, 입원 초기 개입의 중요성,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실무 표준화의 필요성,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퇴원연계서비스 실제 운영 개선뿐 아니라, 전국의 책임의료기관 대상의 사업모델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필수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강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배재용, 2024). 보건복지부는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1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4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이하 퇴원연계서비스)’는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역 내 적절한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2024). 퇴원연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자들의 재입원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감소한 것은 적절한 퇴원 연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퇴원 시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는 치료 이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치료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이에 따라 재입원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Hwang et al., 2024).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하 ‘본원’)은 2020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인 ‘서울케어-서남병원 퇴원연계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2022년에는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본원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한 퇴원연계서비스로 확장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사업대상자는 주치의 협진을 통해 전산 의뢰되어 발굴되며 사업 담당 간호사는 퇴원 후 관리해야 하는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돌봄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혜선과 이윤주(2018)의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이동 제한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퇴원 이후 지속적인 돌봄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원연계서비스의 주요 사업대상자는 주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방효중 외(2024)의 연구에서는 질환 특성에 따라 퇴원 후 환자들의 돌봄 경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사회 자원의 가용성과 연계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환자의 건강관리 수준과 서비스 연속성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장영수 외(2022)의 연구에서는 퇴원환자의 연속적·집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적용하여 이용자 측면에서만 퇴원 요구도 문제 목록과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Choi et al.(2024)의 연구에서는 퇴원 지원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제약,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만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여 퇴원연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퇴원연계서비스의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근골격계 대상의 퇴원연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퇴원연계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퇴원연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대상
가.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연구 참여자 선정은 풍부한 경험과 심층적 탐구를 위해 퇴원연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와 퇴원연계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자로 선정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 근골격계 질환(KCD 코드 기준: S22, S32, S72, S82, M16, M17.0, M41, M43.1, M48.0, M87)으로 입원한 후 주치의로부터 협진 의뢰된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실제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80명 중 서남권을 주소지로 둔 자 40명을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노숙인 시설로 퇴원한 자, 와상·무의식 환자 또는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국문 해독이 어려운 자,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무자 중 12개월 이상 퇴원연계서비스 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제공자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은 이용자 15명, 제공자 10명으로 중도탈락자는 없었다.
나.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1)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특성
본문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5명이 참여하였다.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 2명, 여성 1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5.40(65-86)세였다.
표 1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특성
| (N=15) | ||||||||||
|---|---|---|---|---|---|---|---|---|---|---|
| 참여자 |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거주형태 (주택종류) | 소득 | 교육 수준 | 결혼상태 및 가구형태 | 지각된 건강상태 | 만성질환 | 퇴원연계서비스 인지수준 |
| 1 | 여 | 85 | 서울 서남권 | 무상거주 (연립·다세대주택) | 30만 원 (공적소득) (가족소득) | 무학 | 자녀동거가구 (사별) | 나쁨 |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2 | 남 | 86 | 서울 서남권 | 자가 (연립·다세대주택) | 정보부재 | 정보 부재 | 자녀동거가구 (사별) | 보통 | 고혈압, 심장질환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3 | 여 | 83 | 서울 서남권 | 월세 (연립·다세대주택) | 정보부재 | 고졸 | 자녀·손자동거가구 (사별) | 매우 나쁨 | 저혈압 | 들어본 적 있다 |
| 4 | 여 | 69 | 서울 서남권 | 임대주택 (연립·다세대주택) | 80만 원 (공적소득) | 초졸 | 노인독거가구 (이혼) | 좋음 | 고혈압 | 조금 안다 |
| 5 | 여 | 77 | 서울 서남권 | 월세 (연립·다세대주택) | 50만 원 (공적소득) | 무학 | 노인부부가구 | 좋음 | 없음 | 조금 안다 |
| 6 | 여 | 76 | 서울 서남권 | 정보부재 (아파트) | 50만 원 (공적소득) | 중졸 | 노인부부가구 | 매우 나쁨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7 | 여 | 67 | 서울 서남권 | 월세 (연립·다세대주택) | 84만 원 (공적소득) | 중졸 | 노인부부가구 | 매우 좋음 | 고혈압 | 들어본 적 있다 |
| 8 | 남 | 72 | 서울 서남권 | 자가 (연립·다세대주택) | 50만 원 (공적소득) | 고졸 | 노인독거가구 (이혼) | 좋음 | 없음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9 | 여 | 72 | 서울 서남권 | 임대주택 (연립·다세대주택) | 80만 원 (공적소득) | 고졸 | 노인독거가구 (북한이탈주민) | 좋음 | 없음 | 들어본 적 있다 |
| 10 | 여 | 82 | 서울 서남권 | 자가 (연립·다세대주택) | 30만 원 (공적소득) | 정보 부재 | 노인독거가구 (사별) | 매우 나쁨 | 고혈압, 고지혈증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11 | 여 | 69 | 서울 서남권 | 전세 (아파트) | 50만 원 (공적소득) | 중졸 | 형제동거가구 (미혼) | 나쁨 | 고혈압 | 잘 알고 있다 (설명가능) |
| 12 | 여 | 75 | 서울 서남권 | 정보부재 (연립·다세대주택) | 정보부재 | 중졸 | 노인부부가구 | 보통 | 심장질환 | 잘 알고 있다 (설명가능) |
| 13 | 여 | 69 | 서울 서남권 | 정보부재 (아파트) | 300만 원 (공적소득) | 고졸 | 노인부부가구 | 좋음 | 고혈압, 당뇨 | 들어본 적 있다 |
| 14 | 여 | 65 | 서울 서남권 | 임대주택 (연립·다세대주택) | 70만 원 (공적소득) | 무학 | 노인독거가구 (이혼) | 매우 나쁨 | 고혈압, 우울증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 15 | 여 | 84 | 서울 서남권 | 월세 (연립·다세대주택) | 80만 원 (공적소득) | 초졸 | 노인부부가구 | 좋음 | 폐렴, 천식, 척추협착증 | 모른다 (처음 듣는다) |
거주 지역은 모두 서울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가 3명, 전세 4명(임대주택 포함), 월세 4명, 무상거주 1명, 정보부재 3명이었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 6명, 노인독거가구 5명, 자녀·손자동거가구 3명, 형제동거가구 1명이었으며, 소득은 정보부재 3명을 제외하고 평균 79만 원으로 공적소득 11명, 공적소득·가족소득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3명, 초등학교 졸업 2명, 중학교 졸업 4명, 고등학교 졸업 4명, 정보부재 2명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4명, ‘나쁘다’ 2명, ‘보통이다’ 2명, ‘좋다’ 6명, ‘매우 좋다’ 1명이었으며, 3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12명의 참여자 모두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그 중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복합만성질환자는 7명이었다. 진단받은 만성질환(다중응답)은 고혈압(9명), 고지혈증(3명), 당뇨(2명), 우울증(2명), 심장질환(2명), 저혈압(1명), 갑상선기능저하증(1명), 폐렴(1명), 천식(1명), 척추협착증(1명) 순 이었다. 퇴원연계서비스 인지 수준은 ‘모른다(처음 듣는다)’ 7명, ‘들어본 적 있다’ 4명, ‘조금 안다’ 2명, ‘잘 알고 있다(설명 가능)’ 2명이었다.
2)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특성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의 퇴원연계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10명이 참여하였다.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10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40(28-34)세였다.
표 2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특성
| (N=10) | ||||||
|---|---|---|---|---|---|---|
| 변수 | 성별 | 연령 | 직종 | 최종 학력 | 경력 | 퇴원연계서비스 담당 기간 |
| 1 | 여 | 32 | 간호사 | 대학교 졸업 | 10년 | 43개월 |
| 2 | 여 | 31 | 간호사 | 대학교 졸업 | 8년 | 23개월 |
| 3 | 여 | 34 | 간호사 | 대학교 졸업 | 12년 | 43개월 |
| 4 | 여 | 28 | 간호사 | 대학교 졸업 | 3년 | 25개월 |
| 5 | 여 | 32 | 사회복지사 | 대학교 졸업 | 2년 | 24개월 |
| 6 | 여 | 28 | 의료사회복지사 | 대학교 졸업 | 4년 | 43개월 |
| 7 | 여 | 31 | 의료사회복지사 | 대학교 졸업 | 8년 | 16개월 |
| 8 | 여 | 33 | 의료사회복지사 | 대학원 졸업 이상 | 7년 | 43개월 |
| 9 | 여 | 34 | 의료사회복지사 | 대학원 졸업 이상 | 11년 | 43개월 |
| 10 | 여 | 31 | 의료사회복지사 | 대학교 졸업 | 8년 | 43개월 |
직종은 간호사 4명, 의료사회복지사 6명이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8명, 대학원 졸업 이상 2명이었다. 퇴원연계서비스 담당 기간은 평균 34.6개월로, 이들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에서 퇴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연구도구
가.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심층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서남병원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에 관한 경험은 어떠하였는가?’를 연구의 배경 질문으로 하였으며, 기초질문과 이용경험 질문으로 나누어 기초질문 5문항, 이용경험 상위질문 4문항, 하위질문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나.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심층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서남병원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경험은 어떠하였는가?’를 연구의 배경 질문으로 하였으며, 기초질문과 이용경험 질문으로 나누어 기초질문 2문항, 이용경험 상위질문 5문항, 하위질문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4).
표 4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4. 자료수집 절차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 면담자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인과 퇴원연계서비스 실무 경험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가진 공동연구자 3인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녹음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자택, 자택 근처 카페, 복지관 사무실 등)에서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평균 60분 이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필사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수행한 연구자 4인은 Krippendorff(2018)의 내용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고전적 분석 전략(classical analysis strategy)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
➀ 1단계 모으기(compiling): 수집된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별로 필사된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퇴원연계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대해 의미 있는 문장 또는 절과 구에 밑줄을 그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
➁ 2단계 나누기(disassembling): 추출된 문장이나 구를 엑셀파일에 정리한 후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해 코드를 형성하였다.
-
➂ 3단계 재배열하기(reassembling): 재구성된 코드를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여 하위범주를 나눈 후, 다시 범주화 하였다.
-
➃ 4단계 해석하기(interpreting): 재배열된 범주를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로 묶어 묘사하여 기술하였다.
-
➄ 5단계 결론 내리기(concluding): 퇴원연계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각각의 기술된 주제를 통합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이 제시한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근거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면담내용을 녹음하면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최소 두 번 이상 녹음파일을 주의 깊게 청취하였다.
둘째,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용성을 위하여 진술이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하였고, 참여자 면담 후 면담내용을 바로 필사하고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참여자의 면담을 할 때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경험을 찾음으로써 적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퇴원연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향,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자료수집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각 면담을 마칠 때마다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합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자료 분석 시에는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SEOUL 2024-06-010-00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면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자 본인에게 연구자가 일대일로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 배경과 목적, 절차, 내용, 소요 시간, 이익 및 위험 요소, 대책 및 보상,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어떠한 외부 압력과는 상관없이 연구에는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참여가능하며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나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습득한 녹음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에 보관하여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할애한 시간, 불편 등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30,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연구에 참여한 15명의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대상 일대일 심층면담을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범주 3개, 하위범주 11개로 도출되었다(표 5).
표 5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면담 범주
| (N=15) | |
|---|---|
| 범주 | 하위범주 |
| 퇴원연계서비스 이용방해요소 |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 |
|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 관리(self-care) 욕구 | |
| 충분하지 못한 정보 제공 | |
| 만족스러운 퇴원연계서비스 | 필요한 서비스 적시 제공 |
| 집에서 돌봄을 줄 수 있는 돌봄 제공자의 연계 | |
| 퇴원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와 추가적 지원 | |
| 건강관리 역량강화 | |
|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 |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
|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지원 | |
| 퇴원 후 지속적 건강관리 | |
| 공백 없는 돌봄 | |
도출된 범주는 ‘퇴원연계서비스 이용방해요소’, ‘만족스러운 퇴원연계서비스’,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방해요소
1)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했다. 매일 찾아오는 것 보단 꼭 필요한 상황에 도움받길 원하였으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부의 집안일만을 도움받길 원하였다. 또한 기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었으며, 개인 보장구를 제공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감을 느꼈다. 일부의 서비스의 경우는 경제적 자격 기준 제한으로 자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일 동안 계속 나와서 우리 집에 할 일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오는 것보다 내가 오늘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누가 병원 좀 예약 좀 해줘 같이 가주고 딱 내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게 좋아요.”(참여자2)
2)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 관리(self-care) 욕구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 중 다수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 관리(self-care) 욕구가 강하였는데 일정 수준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버티고자 하였으며, 도움을 받는 행위가 자존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내가 완전히 거동이 안 되면 필요하겠는데, 혼자 이렇게 천천히 다니고 하면 되니까.. 그때 사람을 한 번 붙여줘서 같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한테는 별로였어요.”(참여자13)
3) 충분하지 못한 정보 제공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는 퇴원연계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입원 당시 퇴원연계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서비스 목적 및 이용 방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특히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퇴원 이후 연계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그것이 퇴원연계서비스의 일환이란 점을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신체적 제약이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나.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방해요소
1) 필요한 서비스 적시 제공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퇴원연계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원,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도움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퇴원 이전부터 서비스 연계가 사전에 이루어져, 퇴원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2) 집에서 돌봄을 줄 수 있는 돌봄 제공자의 연계
대부분의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등의 자원이 연계된 점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수술 직후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 수행이 어려운 시기에 돌봄 제공자의 존재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퇴원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와 추가적 지원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퇴원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과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시락 배달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혈압 측정 및 약물 복약 여부 확인 등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 방문은 퇴원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건강관리 역량강화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신체적 제약을 지닌 고령자로, 퇴원 후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퇴원 이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건소를 통해 제공받은 의료기기 사용 교육은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퇴원하고 나서 제일 필요했던 거는 그 호흡기 있잖아. 호흡기. 그거 여기다 갖다 놓고 석 달 동안 썼어. 퇴원 후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호흡기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좋았어요.”(참여자10)
다.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
1)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로 퇴원 후 이동 또는 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낙상 예방이 가능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원했다.
2)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지원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외출이 필요하지만, 이동에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거동 불편, 교통수단 접근성 부족, 주변의 도움 부족 등으로 인해 외출 자체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였고 일부는 휠체어나 워커, 지팡이 등의 보조기구나 가족의 도움을 통해 외출하지만, 이는 자율적인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3) 퇴원 후 지속적 건강관리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였다. 특히 병원에서 제공되던 운동, 치료, 의사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관리가 퇴원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에서 스스로 운동이나 치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물리적 제약과 공간의 부족으로 일상적인 운동이나 회복을 위한 활동이 힘들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 방문 자체가 불편하고, 이를 위해 외출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방문 진료, 서비스와 같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대상 일대일 심층면담을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범주 3개, 하위범주 10개로 도출되었다(표 6).
표 6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면담 범주
| (N=10) | |
|---|---|
| 범주 | 하위범주 |
|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방해 요소 | 정보 부재에 따른 인식 부족 |
| 이용자의 비협조적 태도 | |
| 자원 연계 어려움 | |
| 퇴원연계서비스 성공 요소 | 대상자 맞춤형 퇴원연계서비스 홍보 |
| 퇴원연계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 |
|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 |
| 지속가능한 퇴원연계서비스 마련 | |
| 성공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지체계 | 충분한 대상자 개입 시간 확보 |
| 퇴원 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 | |
| 자가관리(self-care) 향상을 위한 연속적 개입 | |
도출된 범주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방해요소’, ‘퇴원연계서비스 성공 요소’, ‘성공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지체계’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방해 요소
1) 정보 부재에 따른 인식 부족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취약계층만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인식하여 도움 받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가 동거하지 않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실질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조차 거부하며 지원 자체를 회피한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퇴원 후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퇴원연계서비스를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적 돌봄이라는 서비스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아들, 딸 다 있으니,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면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이거나 직장을 다니셔서 돌봄을 주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거부를 하세요.”(참여자1)
2) 이용자의 비협조적 태도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퇴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일부 이용자는 과거의 보건소나 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회상하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제공자는 환자 평가 시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계구조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파악해야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환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에 민감한 질문에 대해 불편감을 표현하거나 서비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셨는데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다 됐다고 하세요.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시고요.”(참여자6)
3)자원 연계 어려움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연계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퇴원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정보 수집, 자원 탐색, 기관 의뢰 등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 연계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퇴원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인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복지관 등 기존 프로그램은 시간, 인원, 이용 방식에 제약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퇴원이 임박한 환자는 당장의 퇴원연계서비스를 요청할 때 시간의 촉박함과 기관 협조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요. 퇴원연계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 상담을 통한 정보 파악과 필요한 자원 모색,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절차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퇴원 임박한 환자가 의뢰 오는 경우에는 연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9)
“환자는 방문진료·방문서비스 시에 처방이나 주사 등을 원하지만 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을 연계하고 있어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요. 특히나 물리치료 같은 걸 집에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방문재활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환자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의료분야는 연계가 어려워요.”(참여자9)
나. 퇴원연계서비스 성공 요소
1) 대상자 맞춤형 퇴원연계서비스 홍보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대상자 맞춤형 퇴원연계서비스의 효과적인 홍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가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임을 전달할 수 있는 대중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용자가 주로 노인 환자임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익숙한 의료진이 퇴원연계서비스를 함께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신뢰 형성과 수용도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하였다.
“노인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퇴원연계서비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 같아요. 풀어서 설명해드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시고요. 주치의나, 병동 간호사처럼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같이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6)
2) 퇴원연계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공통적으로 업무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 말하였다. 이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평가 및 계획 수립까지 다학제팀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굴되어야 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퇴원연계서비스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관담당자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이더라도 기관마다 연계서식이 상이하여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며 이에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4) 지속가능한 퇴원연계서비스 마련
또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퇴원연계서비스 마련은 지역에서 연속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협력하여 개발하거나 통일된 자원리스트를 마련하는 것, 적합한 시기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퇴원연계서비스의 성공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다. 성공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지체계
1) 충분한 대상자 개입 시간 확보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자가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상자 개입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였으며, 이는 퇴원 후 환경·신체적 기능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퇴원이 임박한 환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원연계서비스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 및 신청서 제출, 논의 등을 위해 최소 2-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 연계를 위해 퇴원을 미뤄야 하는 경우도 생길 때도 있다 보니 더 빨리 개입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참여자8)
2) 퇴원 후 맞춤형 서비스 연계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근골격계 질환 퇴원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퇴원 후 환경과 신체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수술 후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병동간호사의 일회성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퇴원 이후에도 보건소 건강동행팀이나 퇴원연계 간호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질환의 특성상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가 많고,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부재하거나 제한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재가서비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술하신 분들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퇴원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가 중요해요. 주의해야 할 자세도 있구요. 퇴원할 때 병동간호사가 설명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세요. 이런 환자들은 보건소 건강동행팀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퇴원연계팀 간호사가 전화나 방문으로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요.”(참여자4)
3) 자가관리(self-care) 향상을 위한 연속적 개입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퇴원환자의 자가관리(self-care) 역량 향상이 퇴원연계서비스의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의 목적은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위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과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문진료 및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해 퇴원 후 환자의 약물복용 상태나 만성질환 관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환자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재입원하고, 지역사회 연계가 무산되며 지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자조모임과 같은 지지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개선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15명과 제공자 10명을 대상으로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와 퇴원연계서비스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퇴원연계서비스 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퇴원연계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퇴원연계서비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퇴원 후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우려됨에도 타인의 도움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자기 관리 욕구를 침해 받는다고 생각하여 제공된 서비스 중 일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입원 당시 퇴원연계서비스 제도를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참여 동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지원받지 못했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자발적 거부, 낮은 사업 인지도, 외부 지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이 퇴원연계서비스 개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퇴원연계서비스 정보가 이용자의 건강정보 이해수준에 맞춰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건강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으며, 건강정보 이행능력이 높으면 건강행위 수준 또한 높았다고 하였다(정정희, 김정순, 2014). 아울러 이러한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노인의 연령, 학력, 월 소득, 사회 활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전달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보 부족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상태 등에 대하여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원 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퇴원 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의료, 복지, 재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퇴원연계서비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하며 퇴원연계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입원 초기부터 다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퇴원 직후 자택에서 돌봄 및 간병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서비스 제공 시점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만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원 초기 단계부터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퇴원계획 수립과 자원 연계를 위한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비스의 적시성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한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입원시 또는 입원 초기에 퇴원연계서비스 의뢰는 퇴원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탐색에 유리하며, 퇴원예정일 등의 정보를 연계기관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적시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일부 제공자는 퇴원이 임박한 환자의 퇴원연계서비스 의뢰가 협진 오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퇴원을 미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이 퇴원 후 연계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퇴원 전 건강상태와 이에 따른 치료 요구의 변화를 가능한 한 조기에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김윤숙 외, 2018), 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원 시점에서 1~2주 전부터 개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의뢰 및 협진 요청 즉시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김민아 외, 2023). 이처럼 입원 초기 개입의 중요성은 단지 퇴원계획의 원활한 수립뿐만 아니라,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원기간 단축과 더불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경험으로 이어져 퇴원연계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환자를 평가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다학제적 협력체계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평가되었다(Choi et al., 2024).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대상자 선정, 욕구사정 및 퇴원계획 수립, 자원 연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학제 간 협업을 통해 의료·복지 간 연계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시 환자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지침이 부족하여 제공자의 역량에 따라 연계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자원 연계를 위한 사정이 퇴원연계사업 담당자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 자원을 발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김민아 외, 2023).
이에 따라, 퇴원연계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퇴원연계 사정도구(access tools)의 개발, 정확한 자원연계 리스트 확보, 시급하게 해결 해야하는 미 충족 욕구 식별을 통한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실무지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지역사회 연계자원 정보조사 및 갱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퇴원연계서비스는 자가관리(self-care)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는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건강상태나, 지속되는 근골격계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과 건강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퇴원 후 신체 기능 회복기간 동안 스스로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단순한 가사지원만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등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드로니나 율리아 외, 2022)에서도 노인들은 퇴원 후 전환기 돌봄서비스 중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퇴원 후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노인 환자가 퇴원 후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한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는 수술 후 건강관리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노인 환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팀(건강동행팀), 돌봄 SOS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퇴원 이후에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에서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재입원과 입원위험이 감소했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Lee et al., 2024).
또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근골격계 만성통증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근골격계 만성통증 관리 전략과 통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정혜선, 이윤주,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가관리(self-care)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갖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입원 후 이루어지는 치료 및 회복 과정과 퇴원 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15명 중 12명(80%)이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그 중 복합만성질환자는 7명(46.6%)이었다. 근골격계 만성 통증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정혜선, 이윤주, 2018),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만성통증 질환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한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들은 각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근골격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만성질환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이 이러한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정보 부족, 이용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고하였다. 따라서 퇴원 전 의료기관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복지관 등 연계기관과 프로그램 사전 등록 협의와 조기 참여를 위한 동행지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 통증을 겪는 노인들이 질환 관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로 서울 서남권으로 퇴원한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 상병코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단일기관 중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질환적 외연의 확장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책임의료기관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의 사업담당 기간과 경력이 상이하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숙련도가 달라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가 연계한 서비스를 파악함에 있어 ‘유용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의 심층면담에 대해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한 퇴원연계서비스 중 유용하지 않은 서비스 유형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용자와 제공자의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퇴원연계서비스의 효과적 설계와 양측의 경험을 모두 조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퇴원연계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및 제공자 간 인식의 차이, 입원 초기 개입의 중요성,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실무 표준화의 필요성,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은 퇴원연계서비스 실제 운영 개선뿐 아니라, 전국의 책임의료기관 대상의 사업모델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2024). 202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
, , , , & (2024). Association Between Home-Base Primary Care and Postdischarge Outcom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26(2), 105-41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2-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25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21

- 1221Download
- 2120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