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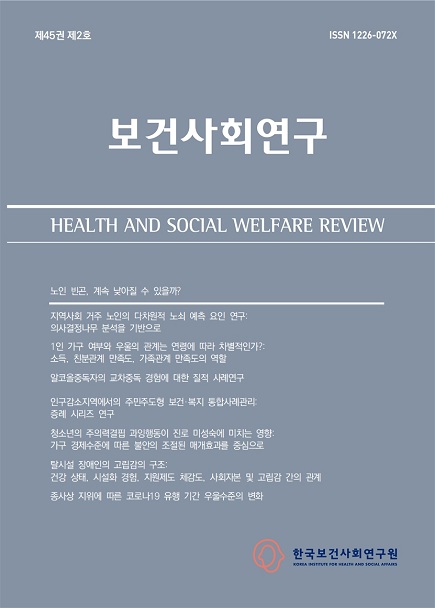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 패널로짓 분석
Relationship betwee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Energy Poverty among Energy Voucher Users: Panel Logit Analysis
Lee, Joungmin1; Kim, Jinseok2*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517-542,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51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의 주요한 에너지빈곤 완화 정책이지만, 이용자의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에도, 기존 정책은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가운데에서도 주거상태가 열악한 경우 에너지빈곤에 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주거유형, 난방유형, 주거환경의 질이 에너지빈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에너지빈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향후 정책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문적으로는 정량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지역적 차이 및 에너지 요금 구조 등 에너지빈곤의 맥락적 특성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energy poverty among energy voucher user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3th (2017) to the 17th (202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was applied to 1,127 households with experience using energy vouchers. The study employed energy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sidered vulnerable housing factors― such as housing type, heating type, and physical housing environment―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come, residential area, household size, occupancy type, and reg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energy voucher users residing in housing with poor energy efficienc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in better residential con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energy welfare policies should extend beyond financial support for energy costs to include measures that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housing environments.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빈곤 경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3차(2017년)~17차(2021년) 자료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는 1,127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패널로짓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주거환경(주택유형, 난방시설, 주택의 물리적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대사회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의 규모와 속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임길환, 2024).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계 차원에서도 에너지비용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2022년 한 해 동안 주택용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각각 인상되었으며(김종익, 김민규, 2023), 특히 2022년 겨울철 연료 가격 상승은 소득 1분위 가구의 연료비를 전년도 대비 30% 증가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악화시켰다(류이근,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보조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이 있다. 그중 에너지바우처는 전체 에너지복지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며, 2023년 초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2배로 확대하는 등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다(이상민, 신희진, 2023). 박명지(2022)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해외 에너지복지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에너지 비용지원만으로는 에너지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빈곤은 다차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현주, 2018; 조가영, 2022; 한상운 외, 2019; 홍정훈, 2023).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에 거주하거나 비효율적인 냉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 이용환경이 열악하여, 에너지구입비용을 지원받아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홍종호 외, 2018).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지원책으로 에너지 이용 부담을 촉진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현경, 2015; 오수미, 진상현, 2021). 이와 같은 결과들은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용 환경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거지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에너지이용환경개선 정책은 탄소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김종우, 박지용, 2020; 김현경, 김근혜, 2017; 이현주, 2018; 한상운 외, 2019).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예산에서 에너지이용환경 개선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책적 자원배분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 즉 에너지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 채 에너지 비용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경감이라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에너지빈곤 관련 요인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복지 정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지원을 넘어 에너지이용환경 개선을 동반한 다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정책과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를 다룬 사례가 있으나 에너지복지 제도 이용 주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김하나와 임미영(2015)은 주거특성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 포함 가구의 에너지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오수미와 진상현(2021)은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변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의 에너지복지 제도 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지 에너지이용환경과 에너지빈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에너지빈곤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이용환경과 에너지빈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에너지바우처 이용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이 연구는 에너지복지 정책으로서 에너지이용환경개선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 문제 해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Ⅱ. 문헌검토
1. 에너지빈곤 개념과 측정
에너지빈곤은 일반적으로 일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UN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7번째 목표로 보편적 에너지 접근을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UN, 2015),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보장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귀희, 2022). 학계에서는 에너지빈곤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González-Eguino, 2015)나 ”사회적-물질적으로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Bouzarovski & Petrova, 2015)로 정의한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일하게 합의된 에너지빈곤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빈곤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진상현 외, 2010). 절대적 에너지빈곤은 개별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최저광열비 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구로 측정된다(신정수, 2011; 오수미, 진상현, 2021).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라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평균적인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상대적 측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박광수, 2006; 이건민, 2015). 반면, 상대적 에너지빈곤은 TPR(Ten Percent Rule, 이하 TPR), LIHC(Low Income High Cost, 이하 LIHC), 2M(Twice the national Median)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사회 일반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이 중 가구 소득 대비 에너지 이용 비용이 10%를 초과할 경우 에너지빈곤층으로 분류하는 TPR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다(조하현, 김해동,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을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TPR 지표에 따라 측정하였다. 에너지는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각 사회마다 최소한의 에너지 필요량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 수준에서 에너지빈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절대적 에너지빈곤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너지복지 제도가 도입될 당시 TPR 지표가 설정된 이후(국무총리실, 2008; 녹색성장위원회, 2009), 추가적인 논의가 발전되지 않았다(이건민, 2015). 이 외에 에너지빈곤 지표를 명시한 최근 정부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에너지복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법 또한 관련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TPR 지표를 활용하여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가 인식하는 수준에서 에너지빈곤을 확인함으로써 분석 결과와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TPR 지표가 지닌 한계점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TPR 지표는 고소득층 중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저소득층 중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저소득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고소득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에 포함되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TPR 지표를 사용하여도 고소득 가구를 배제하는 효과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중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저소비 가구는 2차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직접 조사 없이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며 본 연구는 TPR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빈곤의 상대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에너지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에너지빈곤 요인과 주거환경
에너지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소득, 에너지효율성, 에너지 비용이 대표적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독립적으로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준다(황인창 외, 2020; 진상현 외, 2010). 특히 이들이 에너지빈곤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은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이 낮은 에너지 장비를 사용하면 에너지 요금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악순환을 만든다(Team & Baffert, 2015).
그림 1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악순환 구조)
출처: “Energy poverty and vulnerable consumers in the energy sector across the EU: analysis of policies and measures”, Team & Baffert, 2015, Policy, 2(64-89), 4, 재구성.
이 중에서 주거환경은 에너지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하나, 임미영, 2015; 김현경, 2015; 조윤재, 2019; Martin, 2022). 노후하거나 단열성능이 열악한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된다. 또한, 효율이 낮은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주거환경은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빈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김현경, 2015; 이현주, 2019; 신동면, 이주하, 2019; 이은솔 외, 2019; 김종우, 박지용, 2020).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요인 중 주택유형, 주택면적, 건축연도, 난방유형 등이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유형은 건물의 단열성능과 난방유형에 띠라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건물마다 필요한 연료의 양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김하나, 임미영, 2015; 홍종호 외, 2018).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분석한 홍종호 외(2018)에 의하면 아파트는 난방 효율이 높아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총에너지 소비가 적은 경향이 있다. 단독주택은 위아래 이웃을 통한 단열효과가 없는 반면, 아파트는 단열성이 좋고,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원을 사용함으로 거주 가구의 에너지 이용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하나, 임미영, 2015; 신동면, 이주하, 2019; 최문선 외, 2013). 한편, 에너지빈곤층은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다(김하나, 임미영, 2015; 윤태연, 박광수, 2017; 황인창 외, 2020). 이를 통해 주거유형에 따라 에너지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주택면적은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요인으로 꼽힌다(오수미, 진상현, 2021; 김하나, 임미영, 2015; 황인창 외, 2020; 홍종호 외, 2018; 이현정, 2012; 이성근, 최도영, 2005; Belaïd, 2017; Estiri, 2014). 특히, 오수미와 진상현(2021)에 의하면 주거면적은 에너지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에너지빈곤의 정도가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하나와 임미영(2015)은 가구원당 사용 면적이 넓을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빈곤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건축연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황인창 외, 2020; 홍종호 외, 2018; 노승철, 이희연, 2013; 이현정, 2012; 이성근, 최도영, 2005). 오래된 건물의 경우 단열 및 환기 성능이 낮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김현경, 2015; 황인창 외, 2020).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완공된 주택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전기와 가스를 주로 사용하지만, 9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홍종호 외, 2018).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이에 따라 면적이 넓고,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거요인은 난방유형 및 난방연료이다(박광수, 2019; 홍종호 외, 2018; 임기추, 2013; 윤소원 외, 2010; Belaïd, 2017; Team & Baffert, 2015). 난방유형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난방방식 자체의 에너지 효율 및 난방 운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먼저, 난방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방식은 크게 지역난방, 중앙난방, 개별난방이 있다(김동희 외, 2008). 이 중에서 지역난방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열(온수)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난방설비로 다른 유형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한건택, 2007; 한국지역난방공사, n.d.).
한편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을 열효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중앙난방은 지역난방과 같이 대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점에 에너지 이용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난방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연식이 오래되어 열교환기가 노후화되어, 에너지 사용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박순봉, 박상영, 2023). 특히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중앙난방 방식이 노후화된 경우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서울특별시, 2023). 반면, 개별난방은 기름보일러와 도시가스 보일러를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연료가 저렴하고 사용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 가구 수가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실례로 서울시의 경우 개별난방 중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황인창 외, 2020).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의 효율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중앙난방의 경우 개별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을 것이라 판단한다.
다음으로 난방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에너지 연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난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박광수, 2019). 주택용 난방을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도시가스, 전기, 기름(등유), 연탄 등이 있고, 이들의 열 생산방식, 에너지원 가격 변동, 소득 수준에 따라 난방유형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에너지원에 따라 열 생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에너지 이용에 차이가 난다. 예시로 연탄은 연료의 특성상 한번 사용하면 중간에 멈추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 보일러 등은 이용자가 온도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이용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에 따라 연료 가격에 차이가 있고, 전쟁 또는 국내 탈탄소 정책 등에 따라 연료별 가격 변동에 차이가 있어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의존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석탄, 석유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탄 및 등유 이용 가구는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지혜, 2023). 연탄과 등유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박광수, 2019; 김현경, 2015), 에너지원에 따라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더불어, 난방유형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저렴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스 또는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연탄과 석유 난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느껴 에너지 소비 수준이 낮은 편이다(김현경, 2015; 박광수, 2019). 또한, 에너지시민연대(2020)에서 실시한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에너지빈곤층은 비효율적 에너지원(등유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등유, 연탄 등 효율이 낮은 에너지원 및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개별난방을 이용하여도 에너지원에 따라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에너지빈곤 경험은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에너지빈곤 경험의 위험 차이가 발생한다. 주택을 소유한 이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 투자 주체인 반면, 임차인은 에너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김창훈, 이지연, 2014). 예를 들어, 만약 집주인이 에너지 효율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처럼 자가가 아닌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설비 개선에 대한 제약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위험이 커진다 (Burbidge & Bouzarovski, 2024). 이에 더하여 저소득 임차인의 경우 다른 임차인에 비해 가계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아져 왔으며(Bird & Hernández, 2012), 점유형태는 저소득 임차 가구의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남수현과 박광수(2020)에 의하면 위도나 내륙과 같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충천북도의 경우 위도가 높으면서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접근 가능한 에너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접근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접근 가능한 에너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접근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은 전력망 및 다양한 에너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박진호, 설윤, 2016). 이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 수준, 접근 가능한 에너지원 및 난방유형에 따라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의 주거요인으로는 조명·취사·전자기기(임기추, 2013; 윤소원 외, 2010), 주거 층(Team & Baffert, 2015), 단열·창문·바닥(황인창 외, 2020), 주택개조여부(Belaïd, 2017), 방 개수(Estiri, 2014)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에너지복지 제도와 에너지바우처
가. 에너지복지 제도
에너지복지 제도는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사용 환경과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한국에너지재단, n.d.)’로 에너지법 제4조(2023)와 동법 제16조의2(2023)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 제도이다. 2007년 에너지복지원년이 선포된 이후, 동 제도는 현재까지 약 18년간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에너지복지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감사원, 2019). 이는 운영체계의 불안정성과 예산 편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2007년 에너지복지가 시행되던 당시,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바우처의 시초인 연탄쿠폰 사업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교체로 인하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되었고, 한국에너지재단 주택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1). 이 과정에서 재단과 공단 간 중복된 업무 발생, 유사 지원책에 대해 다른 지원자 선정 방식 적용,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의 차이 등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감사원, 2019). 이에 더하여 에너지재단은 운영 지속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이다(조해람, 2023). 이처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운영 기관이 바뀌거나, 운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에너지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복지에 한국에너지공단의 개입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다양한 연료 지원과 보건복지부 저소득 가구 정보 접근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또한 증가하였다. <표 1>의 최근 5개년 에너지복지 정책 사업비 및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비는 2019년 99,702백만 원에서 2023년 190,963 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의 경우 ‘22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에너지복지 사업 중 에너지바우처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상민, 신희진, 2023). 사업비의 증대는 2019년부터 하절기 냉방 에너지를 지원하고, 이용대상자를 확대한 결과이다. 2022년에는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기간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서 다른 해에 비해 사업비 증가 폭이 컸다. 또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22년 12월)과 민생안정대책(’23년 1월)을 근거로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의 사업비가 증대하였다. 반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19년 81,865백만 원에서 2023년 99,599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에너지복지 사업비와 비교했을 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즉, 현 에너지복지 제도는 에너지빈곤을 야기하는 다양한 차원의 원인에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이현주, 2019). 이는 결국 다차원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표 1
2019~2023년의 에너지복지 사업비 (예산액 기준, 추경 포함)
| (단위: 백만 원) | ||||||
|---|---|---|---|---|---|---|
| 사업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안) |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 99,702 | 167,517 | 143,605 | 230,556 | 190,963 | |
| 한국에너지공단 동절기바우처 | 66,708 | 72,011 | 104,639 | 156,267 | 129,656 | |
| 한국에너지공단 하절기바우처 | 4,415 | 6,057 | 7,735 | 47,143 | 36,851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 25,172 | 29,264 | 28,320 | 23,600 | 21,712 | |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1) | 2,480 | 2,480 | 1,984 | 1,674 | 1,395 | |
| 사업운영비 | 927 | 955 | 927 | 1,872 | 1,349 | |
| 전기사업자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 - | 56,750 | - | - | - | |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 | 81,865 | 76,665 | 86,898 | 86,898 | 99,599 | |
출처: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 황인창 외, 2020, 서울연구원, p. 22;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정책실, 2021, 산업통상자원부, p. 756,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에너지정책실, 2023, 산업통상자원부, p.1488,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2), 2015년 부터 겨울철 에너지 요금을, 2019년부터 여름철 에너지 요금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유재국, 2019).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를 통해 지급되며, 가상카드의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비용이 전달되어 이용자의 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이나 영업소를 통해 직접 에너지원(예: 난방유, 가스, 전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한국에너지공단, n.d.). 에너지바우처의 이용 대상과 이용 금액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에너지 이용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에너지빈곤 문제를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박명지, 2022; 유재국, 2019; 이은솔 외, 2019).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에너지바우처 정책은 소득 수준을 토대로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김현경, 2015; 이훈, 2020; 오수미, 진상현, 2021). 에너지바우처 이용 대상은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기준3)을 충족하는 세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 기준은 오로지 소득을 기반으로 에너지빈곤을 상황을 고려할 뿐, 주거환경이나 에너지원 효율에 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에너지 효율 환경이 낮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심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일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정책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정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2년 겨울 에너지 연료 요금 인상과 한파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2배가량 인상된 금액을 유지하며 정책의 범위와 지원 금액을 <표 2>와 같이 대폭 확대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23b).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의 운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담당 부처는 앞으로도 소득 빈곤과 가구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요금 지원 확대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에너지정책실, 2023).
표 2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변경 전후 비교
| (단위: 원) | ||||||||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절기 | 31,300 | 31,300 | 46,400 | 46,400 | 66,700 | 66,700 | 95,200 | 95,200 |
| 동절기 | 118,500 | 248,200 | 159,300 | 335,400 | 225,800 | 455,900 | 284,480 | 507,500 |
| 계 | 149,800 | 279,500 | 205,700 | 381,800 | 292,500 | 522,600 | 379,680 | 699,700 |
출처: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한국에너지공단, 2023a; “2배 더 따뜻한 겨울,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 한국에너지공단, 2023b.
에너지바우처의 한계는 선정기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에너지원 전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전환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연탄사용가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감사원, 2019). 한편, 연탄쿠폰을 통한 바우처 지원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연료비 상승에 따른 가구 난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한국광해광업공단, 2023). 그러나 이는 결국 에너지빈곤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우처 이용자의 에너지원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바우처 운영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에너지빈곤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금액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 듯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에 에너지를 붓고 있는 것과 같다. 특히 이는 비효율적인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아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2019; 김현경, 2015). 이는 저소득가구 중 유사한 경제적 수준에 위치하여 있어도, 에너지효율 정도에 따라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에너지빈곤을 상황에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이 에너지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의 13차(2017년)부터 17차(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전국에 거주하는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한다(정은희 외, 2022). 해당 자료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에너지바우처 이용 여부, 주거환경 변수, 에너지빈곤 측정 가능 변수를 포함하고, 해당 변수들을 매해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한국에너지복지패널 자료 중 가구용 데이터에서 당해 연도 에너지바우처 이용 여부 질문에 ‘있다’라고 보고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데이터에서는 계절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이 계절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한 번 신청하면 동절기와 하절기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현황을 조사 차수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13차 567명, 14차 591명, 15차 537명, 16차 573명, 17차 773명이다. 각 년도의 조사가구 수는 최소 537명에서 최대 773명으로 매해 참여자 수가 다른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며 총 분석대상자는 1,127명이다.
2. 변수설정
종속변수인 에너지빈곤은 TPR 지표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광열비 지출이 10% 이상인 경우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한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과 월평균 난방비 변수를 연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월평균 광열비를 연평균 기준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에 12를 곱한다. 이후 연평균 가처분소득을 추정된 연평균 광열비의 값으로 나누고, 이 값이 10% 이상인 경우 에너지빈곤 가구(=1)로 계산하고, 아닌 경우를 에너지비빈곤 가구(=0)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주택유형, 난방시설,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열 및 창호, 주택개조여부 등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주거의 구조·성능·환경)에 대한 인식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주택, 기타로 구분했으며 상대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아파트(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오피스텔4))를 기준변수 1로 설정하고, 주택(일반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은 2,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는 3으로 설정하였다. 난방시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개별난방 방식 중 가스보일러와 전기보일러를 기준변수 1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난방유형에 따라 중앙난방은 2, 개별난방이지만 에너지원에 대한 부담이 높은 난방유형으로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나무-석탄 보일러는 개별난방2로 묶어 3, 나머지 연탄-재래식(땔깜) 아궁이, 전기장판, 기타는 개별난방3으로 묶어 4로 설정하였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질문으로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와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가구는 0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가구는 1로 설정하였다. 이 외의 주거요인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독립변수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정의하여, 주거면적과 같이 면적이 넓을수록 빈곤에 처해지는 경우나 방의 개수 등은 취약한 주거 환경이라 정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통제변수는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은 연평균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주거면적은 연속형 변수이고, m2을 기준으로 값이 클수록 주거 면적이 넓음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으로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유형태는 임차유형에 따라 자가를 기준변수로 1, 전세는 2, 보증부월세는 3, 월세(사글세)는 4, 기타는 5로 설정했다. 거주지역은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울은 1, 수도권(인천/경기)은 2, 부산/경남/울산은 3, 대구/경북은 4, 대전/충남/세종은 5, 강원/충북은 6, 광주/전남/전북/제주도는 7로 설정하였다. 7개 권역 중 서울을 기준변수 1로 설정하였다.
표 3
변수 설명 및 측정 방법
| 변수 | 측정 방법 | |
|---|---|---|
| 종속변수 | 에너지빈곤 | (TPR) 연평균 가처분소득을 월평균 난방비*12로 나눈 값이 10% 이상인 경우 (에너지비빈곤 =0, 에너지빈곤 =1) |
| 독립변수 | 주거유형 | 아파트(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오피스텔) =1 |
| 주택(일반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점포주택, 복합용도 주택) =2 | ||
|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기타) =3 | ||
| 난방유형 | 개별난방1(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1 | |
| 중앙난방 =2 | ||
| 개별난방2(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나무-석탄보일러) =3 | ||
| 개별난방3(연탄-재래식(땔깜)아궁이, 전기장판, 기타 = 4 | ||
| 주택의 물리적 환경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음’에 ‘예’라고 응답한 가구는 =0(기준), ‘아니오’라고 응답한 가구 =1 | |
|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음’에 ‘예’라고 응답한 가구는 =0(기준), ‘아니오’라고 응답한 가구 =1 | ||
| 통제변수 | 소득 | 연평균 가처분소득 |
| 주거면적 | m2 | |
| 가구원수 |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원 수(명) | |
| 점유형태 | 자가 =1, 전세 =2, 보증부월세 =3, 월세(사글세) =4, 기타 =5 | |
| 거주지역 | 서울 =1, 수도권(인천/경기) =2, 부산/경남/울산 =3, 대구/경북 =4, 대전/충남/세종 =5, 강원/충북 =6, 광주/전남/전북/제주도 =7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빈곤 여부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 0보다 큰 경우 개별 에너지바우처 이용가구 i가 t시점에서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Xit는 독립변수(주거유형, 난방유형, 주택의 물리적 환경), Zit는 통제변수(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의 벡터를 나타내며, eit는 μi + νit의 값으로 오차항을 의미한다. μi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동시에 관찰되지 않은 개별특성 효과(unobserved individual effect)를 나타내고, vit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만약 개별특성 오차항 μi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μi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반면 개별특성 오차항 μi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없고 확률 변수로 가정하면,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한다(Baltagi, 2001).
본 연구의 경우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로짓모형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종속변수인 에너지빈곤 여부는 이항 변수로 오차항(ui)을 확률변수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주거요인 변수는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시간-불변 변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표 4>에 의하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차수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21%까지 변화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0.5%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유형의 경우 변화하지 않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음으로 시간-불변 변수를 포함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한다. 더불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의효과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시간-불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 계수(random coefficients), 상호작용항(cross-level interactions), 복잡한 분산 함수(complex variance functions.)를 통해 모형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ell & Jones, 2015).
표 4
독립변수 변화 추이
| (단위: 명, %) | ||||||||
|---|---|---|---|---|---|---|---|---|
| 조사차수(년도) | 주택유형 | 난방유형 | 물리적 특성1 | 물리적 특성2 | ||||
| n | % | n | % | n | % | n | % | |
| 13차(2017) | 0 | 0 | 0 | 0 | 0 | 0 | 0 | 0 |
| 14차(2018) | 17 | 3% | 46 | 8% | 77 | 13% | 74 | 13% |
| 15차(2019) | 12 | 2% | 56 | 10% | 86 | 16% | 80 | 15% |
| 16차(2020) | 14 | 2% | 60 | 10% | 118 | 21% | 109 | 19% |
| 17차(2021) | 18 | 2% | 47 | 6% | 111 | 14% | 107 | 14% |
따라서 본 연구는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로짓모형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주거요인이 에너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모형 분석에 앞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TATA 17.0 MP-Parallel Edit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복지패널데이터의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주는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차부터 17차까지 연구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3세로, 복지패널의 가구주의 전체 평균 65세보다 약 8살가량 높은 수준이다. 성별 구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연구 대상의 약 57%가 여성이며, 전체 복지패널의 여성 비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평균 81%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며, 복지패널의 비중 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 또는 투약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전체차수 평균 86.4%에 해당하며, 이는 복지패널의 평균값인 6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값이 없는 15차를 제외한 연구대상의 평균은 17%에 해당한 반면, 복지패널에서는 4%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다. 생계급여 일반 수급 가구는 평균 80%, 의료급여 중 1종 수급 가구의 비율은 전체 평균 79%, 주거급여 중 특례를 포함한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평균 79%에 해당했다. 반면, 복지패널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9%에 해당하며 연구대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교육 급여는 연구 대상자는 평균 0.24명, 복지 패널은 0.01명에 해당하였다. 다른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급여의 수급자 수가 적은 이유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주의 연령 중 고령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표 5
복지패널 및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특성 | 13차 | 14차 | 15차 | 16차 | 17차 | ||||||
|---|---|---|---|---|---|---|---|---|---|---|---|
| 복지 패널 (n= 6,474) | 연구 대상 (n= 567) | 복지 패널 (n= 6331) | 연구 대상 (n= 591) | 복지 패널 (n= 6,029) | 연구 대상 (n= 537) | 복지 패널 (n= 5,996) | 연구 대상 (n= 573) | 복지 패널 (n= 7865) | 연구 대상 (n= 773) | ||
| 연령(세) | 64세 | 74세 | 64세 | 73세 | 64세 | 74세 | 65세 | 73세 | 66세 | 72세 | |
| 성별 | 여성 | 50% | 58% | 51% | 56% | 51% | 57% | 52% | 58% | 53% | 58% |
| 남성 | 50% | 42% | 49% | 44% | 49% | 43% | 48% | 42% | 47% | 42% | |
| 비경제활동인구 | 38% | 81% | 37% | 79% | 37% | 82% | 38% | 84% | 37% | 80% | |
| 만성질환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중) | 62% | 86% | 63% | 84% | 66% | 87% | 67% | 88% | 68% | 87% | |
| 장애여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 18% | 4% | 18% | - | - | 4% | 20% | 4% | 27% | |
| 생계급여 (일반수급 가구) | 9% | 84% | 9% | 79% | 8% | 82% | 8% | 80% | 9% | 76% | |
| 의료급여 (1종) | 9% | 82% | 9% | 79% | 9% | 83% | 9% | 81% | 8% | 72% | |
| 주거급여 (임차 급여, 특례 포함) | 9% | 82% | 9% | 76% | 9% | 82% | 10% | 81% | 10% | 73% | |
| 교육급여 (명) | .02명 | .12명 | .01명 | .93명 | .01명 | .07명 | .00명 | .05명 | .01명 | .06명 | |
| 주거위치 (지상) | 98% | 95% | 98% | 95% | 98% | 94% | 99% | 95% | 99% | 96% | |
종속변수인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6>과 같다. 전체 조사차수 평균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중 168(27.5%)명이 에너지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차수별로 살펴보면 13차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567명 중 154명(27.2%), 14차년도 591명 중 163명(27.6%), 15차년도 537명 중 160명(29.8%), 16차년도 573명 중 145명(25.3%), 17차년도 773명 중 217명(28%)이 에너지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차수 중 17차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수와 에너지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다른 차수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의 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봄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에너지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최소 25.3%에서 29.8%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6
종속변수 기술통계
| (단위: 명, %) | ||||||||||
|---|---|---|---|---|---|---|---|---|---|---|
| 종속변수 | 조사차수 | |||||||||
| 13차 (n=567) | 14차 (n=591) | 15차 (n=537) | 16차 (n=573) | 17차 (n=773)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에너지빈곤 | 154 | 27.2 | 163 | 27.6 | 160 | 29.8 | 145 | 25.3 | 217 | 28 |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주거유형, 난방유형, 주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값은 <표 7>과 같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13차년도부터 17차년도 모두 주택(일반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점포주택, 복합용도 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오피스텔),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기타) 유형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조사차수의 주택유형을 평균값으로 확인한 결과 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평균 342명(58%), 아파트는 252명(41%), 기타는 27명(1%)에 해당했다. 각 차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3차년도에는 총 567명 중 주택에 340명(59.96%), 아파트 224명(39.51%), 기타 3명(0.53%) 순으로 거주하였다. 14차년도에는 총 591명 중 주택에 351명(59.39%), 아파트 235명(39.76%), 기타 5명(0.83%) 순으로 거주하였다. 15차년도에는 총 537명 중 주택에 312명(48.10%), 아파트 223명(41.53%), 기타 2명(0.37%) 순으로 거주하였다. 16차년도에는 총 573명 중 주택에 326명(56.89%), 아파트 242명(42.23%), 기타 5명(0.87%) 순으로 거주하였다. 17차년도에는 총 773명 중 주택에 406명(52.52%), 아파트 335명(45.92%), 기타 12명(1.55%) 순으로 거주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주거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주거유형의 경우 전체 주거유형 중 차지하는 비율은 14차년도 대비 15차년도에 감소하고, 이때를 제외하고, 기타에 거주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표 7
독립변수 기술통계
| (단위: 명, %) | ||||||||||||
|---|---|---|---|---|---|---|---|---|---|---|---|---|
| 독립변수 | 조사차수 | |||||||||||
| 13차 (n=567) | 14차 (n=591) | 15차 (n=537) | 16차 (n=573) | 17차 (n=773)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주거 유형 | 아파트 | 225 | 39.7 | 236 | 39.9 | 223 | 41.5 | 243 | 42.4 | 356 | 46.1 | |
| 주택 | 340 | 60.0 | 351 | 59.4 | 312 | 58.1 | 326 | 56.9 | 406 | 52.5 | ||
| 기타 | 2 | 0.4 | 4 | 0.7 | 2 | 0.4 | 4 | 0.7 | 11 | 1.4 | ||
| 난방 유형 | 개별난방1 | 296 | 52.2 | 311 | 52.6 | 294 | 54.8 | 335 | 58.5 | 473 | 61.2 | |
| 중앙난방 | 128 | 22.6 | 121 | 20.5 | 107 | 19.9 | 100 | 17.5 | 131 | 17 | ||
| 개별난방2 | 141 | 24.9 | 149 | 25.2 | 130 | 24.2 | 128 | 22.3 | 159 | 20.6 | ||
| 개별난방3 | 2 | 0.4 | 10 | 1.7 | 6 | 1.1 | 10 | 1.8 | 10 | 1.3 | ||
| 주거 환경 인식 | 주택의 물리적 환경1 | 예 | 472 | 83.3 | 512 | 86.6 | 437 | 81.4 | 457 | 79.8 | 623 | 80.6 |
| 아니오 | 95 | 16.8 | 79 | 13.4 | 100 | 18.6 | 116 | 20.2 | 150 | 19.4 | ||
| 주택의 물리적 환경2 | 예 | 490 | 86.4 | 532 | 90 | 434 | 80.8 | 475 | 82.9 | 638 | 82.5 | |
| 아니오 | 77 | 13.6 | 59 | 10 | 103 | 18.2 | 98 | 17.1 | 135 | 17.5 | ||
두 번째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난방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형은 개별난방1(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개별난방2(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나무-석탄보일러), 중앙난방, 개별난방3(연탄-재래식(땔깜)아궁이, 전기장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차수의 난방유형을 평균값으로 확인한 결과 개별난방1을 이용 가구는 평균 346명(57%), 중앙난방은 117명(19%), 개별난방2는 141명(23%), 개별난방3은 8명(1%)에 해당했다. 각 차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차년도의 경우 전체 567명 중 개별난방1을 사용하는 가구는 296명(52.2%), 개별난방2는 141명(24.9%), 중앙난방은 128명(22.6%), 개별난방3은 2명(0.3%)에 해당하였다. 14차년도의 경우 총 591명 중 개별난방1을 사용하는 가구는 311명(52.62%), 개별난방2는 149명(25.2%) 중앙난방은 121명(20.5%), 개별난방3은 10명(1.7%)에 해당하였다. 15차년도 전체 537명 중 개별난방1을 사용하는 가구는 294명(54.8%), 개별난방2는 130명(24.2%), 중앙난방은 107명(19.93), 개별난방3은 6명(1.12%)에 해당하였다. 16차년도 총 573명 중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335명(58.5%), 개별난방 2는 128명(22.3%), 중앙난방은 100명(17.45%), 개별난방3은 10명(1.75%)에 해당하였다. 17차년도의 경우, 전체 773명 중 개별난방1을 사용하는 가구는 473명(61.2%), 개별난방2는 159명(20.6%), 중앙난방은 131명(17%), 개별난방3은 10명(1.3%)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난방유형 중 개별난방1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15차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개별난방2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연도별로 감소했고, 다시 증가하였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비중은 감소하다 17차년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의 경우 13차년도와 19차년도를 제외하고 10명으로 동일하였다.
세 번째 독립변수로 물리적 주거환경1에 해당하는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음’을 전체 조사차수의 평균값으로 확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 500명(82%), ‘아니오’라 응답한 가구는 108명(18%)에 해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13차년도 전체 567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72명(83.3%),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95명(16.8%), 14차년도 전체 591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512명(86.6%),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79명(13.4%), 15차년도 전체 537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37명(86.6%),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100명(18.6%), 16차년도 총 573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57명(79.8%),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116명(20.2%), 17차년도 전체 773가구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623명(80.6%),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150명(19.4%)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물리적 주거환경2에 해당하는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빈도를 전체 조사차수의 평균값으로 확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 514명(84%), ‘아니오’라 응답한 가구는 94명(16%)에 해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3차년도에 전체 567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90명(86.4%),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77명(13.6%), 14차년도 전체 591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532명(90%),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59명(10%), 15차년도 전체 537가구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34명(80.8%),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103명(18.2%), 16차년도 총 573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475명(82.9%),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98명(17.1%), 17차년도 전체 773명 중 ‘예’라고 답한 가구는 638명(82.5%), ‘아니오’라 답한 가구는 135명(17.5%)에 해당했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 1과 2 모두 ‘예’ 또는 ‘아니오’라 응답한 비중이 차수에 따라 변화했으나, ‘아니오’에 비해 ‘예’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을 확인했다.
각각의 통제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인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수, 거주지역의 특징을 차수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먼저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경우 전체 조사차수 평균 1,881만 원에 해당했고, 각 조사차수별로 살펴보면 13차년도에 연평균 1,677만 원(표준편차, 이하 SD=1256.535), 14차년도에 1,880만 원(SD=1760.391), 15차년도에 1,840만 원(SD=2111.418), 16차년도에 1,907만 원(SD=1760), 17차년도에 2,103만 원(SD=1994.082)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의 경우 전체 차수 평균 53.1㎡으로나타났고, 각 차수별로 살펴보면 13차년도에 50.4㎡, 14차년도에 53.0㎡, 15차년도에 52.8㎡, 16차년도에 53.5㎡, 17차년도에 56.1㎡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13차년도에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으로 평균 1.7명, 14차년도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으로 평균 1.8명, 15차년도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으로 평균 1.7명, 16차년도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으로 평균 1.6명, 17차년도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으로 평균 1.7명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전체차수 평균 보증부월세 344명(57%), 자가 123명(20%), 기타 67명(11%), 전세 45명(7%), 월세(사글세) 29명(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전체차수 평균 부산/경남/울산이 126명(20%), 수도권(인천/경기) 116명(19%), 광주/전남/전북/제주도 102명(17%), 서울 91명(15%), 대구/경북 80명(13%), 대전/충남/세종 56명(9%), 강원/충북 41명(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통제변수 기술통계
| (단위: 만 원, ㎡, 명, %) | |||||||||||||
|---|---|---|---|---|---|---|---|---|---|---|---|---|---|
| 통제변수 | 조사차수 | ||||||||||||
| 13차 (n=567) | 14차 (n=591) | 15차 (n=537) | |||||||||||
| Mean (SD) | min | Max | N | Mean (SD) | min | Max | N | Mean (SD) | min | Max | N | ||
| 소득 (연평균/만 원) | 1677 (125) | 460 | 9308 | 567 | 1881 (1760) | 336.2 | 135 | 109 | 1840 (2111) | 124 | 390 63 |
537 | |
| 주거면적 (㎡) | 50 (21) | 10 | 168 | 567 | 54 (23) | 7 | 162 | 130 | 53 (22) | 126 | 139 | 537 | |
| 가구원 수 | 1.7 (1) | 1 | 6 | 567 | 1.785 (1) | 1 | 7 | 70 | 1.667 (1) | 76 | 6 | 537 | |
| n | % | n | % | n | % | ||||||||
| 점유 형태 | 자가 | 108 | 19.05 | 125 | 21.15 | 99 | 18.44 | ||||||
| 전세 | 41 | 7.23 | 46 | 7.78 | 46 | 8.57 | |||||||
| 보증부 월세 | 331 | 58.38 | 327 | 55.33 | 310 | 57.73 | |||||||
| 월세 (사글세) | 32 | 5.64 | 28 | 4.74 | 21 | 3.91 | |||||||
| 기타 | 55 | 9.70 | 65 | 11.00 | 61 | 11.36 | |||||||
| 거주 지역 | 서울 | 98 | 17.28 | 94 | 15.91 | 83 | 15.46 | ||||||
| 수도권 | 109 | 19.22 | 124 | 20.98 | 92 | 17.13 | |||||||
| 부산/경남/울산 | 130 | 22.93 | 126 | 21.32 | 112 | 20.86 | |||||||
| 대구/경북 | 70 | 12.35 | 76 | 12.86 | 71 | 13.22 | |||||||
| 대전/충남/세종 | 43 | 7.58 | 57 | 9.64 | 51 | 9.5 | |||||||
| 강원/충북 | 41 | 7.23 | 36 | 6.09 | 33 | 6.15 | |||||||
| 광주/전남/ 전북/제주도 | 76 | 13.40 | 78 | 13.2 | 95 | 17.69 | |||||||
| 통제변수 | 조사차수 | ||||||||||||
| 16차 (n=573) | 17차 (n=773) | ||||||||||||
| Mean (SD) | min | Max | N | Mean (SD) | min | Max | N | ||||||
| 소득 (연평균/만 원) | 1907 (1485) | 36 | 10799 | 573 | 2102 (1994) | 128 | 1430 | 773 | |||||
| 주거면적 (㎡) | 54 (22) | 78 | 145 | 573 | 56 (25) | 10 | 175 | 773 | |||||
| 가구원 수 | 1.611 (1) | 1 | 6 | 573 | 1.658 (1.1) | 1 | 7 | 773 | |||||
| n | % | n | % | ||||||||||
| 점유 형태 | 자가 | 108 | 18.85 | 175 | 22.64 | ||||||||
| 전세 | 38 | 6.63 | 55 | 7.12 | |||||||||
| 보증부 월세 | 338 | 58.99 | 416 | 53.82 | |||||||||
| 월세 (사글세) | 28 | 4.89 | 35 | 4.53 | |||||||||
| 기타 | 61 | 10.65 | 92 | 11.90 | |||||||||
| 거주 지역 | 서울 | 84 | 14.66 | 100 | 12.94 | ||||||||
| 수도권 | 102 | 17.8 | 153 | 19.79 | |||||||||
| 부산/경남/울산 | 92 | 16.06 | 142 | 18.37 | |||||||||
| 대구/경북 | 92 | 16.06 | 93 | 12.03 | |||||||||
| 대전/충남/세종 | 57 | 9.95 | 74 | 9.57 | |||||||||
| 강원/충북 | 38 | 6.63 | 58 | 7.5 | |||||||||
| 광주/전남/ 전북/제주도 | 108 | 18.85 | 153 | 19.79 | |||||||||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취약한 주거요인이 에너지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χ2 (7) = 4.06, p = 0.772). 따라서 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환경에 따라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통해 임의효과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패널로짓 분석 결과(임의효과 모형)
| 변수명 | OR | SE | z | p | |
|---|---|---|---|---|---|
| 독립변수 | 주거유형(기준변수: 아파트) | ||||
| 주택 | 1.744∗∗∗ | 0.338 | 2.870 | .004 | |
| 기타 | 8.395∗∗∗ | 5.880 | 3.040 | .002 | |
| 난방유형(기준변수: 개별난방1-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 |||||
| 중앙난방 | 1.302 | 0.267 | 1.290 | .198 | |
| 개별난방2(연탄, 기름, 나무-석탄) | 1.878∗∗∗ | 0.366 | 3.240 | .001 | |
| 개별난방3(아궁이, 전기장판, 기타) | 0.404 | 0.229 | -1.600 | .110 | |
| 주택의 물리적 환경(기준변수: ‘예’) | |||||
| 주거환경인식1:‘아니오’ | 1.712∗∗∗ | 0.314 | 2.930 | 0.003 | |
| 주거환경인식2: ‘아니오’ | 0.735 | 0.143 | -1.580 | 0.115 | |
| 통제변수 | 소득 | 0.995∗∗∗ | 0.000 | -15.670 | 0.000 |
| 주거면적 | 1.020∗∗∗ | 0.004 | 4.870 | 0.000 | |
| 가구원 수 | 3.052∗∗∗ | 0.520 | 6.550 | 0.000 | |
| 점유형태(기준변수: 자가) | |||||
| 전세 | 0.904 | 0.257 | -0.350 | 0.724 | |
| 보증부 월세 | 0.609∗∗∗ | 0.130 | -2.320 | 0.020 | |
| 월세(사글세) | 0.351∗∗∗ | 0.116 | -3.170 | 0.002 | |
| 기타 | 1.356 | 0.319 | 1.290 | 0.196 | |
| 거주지역(기준변수: 서울) | |||||
| 수도권(인천/경기) | 1.182 | 0.273 | 0.720 | 0.470 | |
| 부산/경남/울산 | 0.409∗∗∗ | 0.099 | -3.690 | 0.000 | |
| 대구/경북 | 0.632∗∗∗ | 0.168 | -1.720 | 0.085 | |
| 대전/충남/세종 | 1.953∗∗∗ | 0.546 | 2.390 | 0.017 | |
| 강원/충북 | 1.549 | 0.480 | 1.410 | 0.157 | |
| 광주/전남/전북/제주도 | 1.228 | 0.306 | 0.820 | 0.410 | |
| 상수 | 8.837 | ||||
| Wald χ2 (df) | 355.85(20)∗∗∗ | ||||
| Log-Likelihood | -1138.1671 | ||||
| 패널 개인 수 | 1,127 | ||||
| 전체 관측 사례 수 | 3,041 | ||||
임의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주거유형, 난방유형,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에너지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거유형 중 아파트(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주택(일반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점포주택, 복합용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Odds Ratio)이 약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R(SE)= 1.744(0.338), p=.004),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기타)에 거주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이 약 8.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R(SE)=8.395(5.880), p=.002).
한편, 난방유형 중 개별난방1(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을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 개별난방2(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나무-석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승산은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SE)=1.878(0.366), p=.001). 반면 중앙난방, 개별난방3(연탄-재래식(땔감)아궁이, 전기장판, 기타)을 사용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개별난방2는 개별난방1에 비해 에너지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소득 기준 1-2분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이용 부담 수준이 높은 난방유형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물리적 주거환경 1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가구는 ‘예’라고 답한 가구에 비해 에너지빈곤 승산이 약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R(SE)=1.712(0.314), p=.003). 반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물리적 주거환경 2는 에너지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이 1만 원 증가하면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이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SE)=0.995(<0.001), p<.001). 주거면적이 1m2 증가하면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이 약 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R(SE)=1.020(0.004), p<.001).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하면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이 약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R(SE)=3.052(0.520), p<.001). 또한, 점유형태 중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보증부 월세를 이용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은 약 39% 감소했고(OR(SE)=0.609(0.130), p=.020), 월세(사글세)를 이용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은 약 65% 감소했다(OR(SE)=0.351(0.116) p=.002). 반면 전세와 기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중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부산/경남/울산에 거주하는 가구의 에너지빈곤 승산은 약 59% 감소했다(OR(SE)=0.409(0.099), p<.001). 반면 대전/충남/세종에 거주하는 가구는 서울 거주 가구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았다(OR(SE)=1.953(0.546), p=.017). 이 외에 수도권(인천, 경기), 대구/ 경북,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기존 에너지 복지 정책의 에너지비용 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 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유형, 난방유형,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기존의 일시적인 바우처 지원 방식을 넘어, 독의 밑을 메꾸는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제도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취약한 주거 요인으로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따라 에너지빈곤 경험 승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김하나와 임미영(2015), 윤태연과 박광수(2017), 황인창 외(202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열 성능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우처 이용자의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정 기준 외에 주택유형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효율성이 높은 주택유형에 거주할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적다는 결과는, 주택 및 기타 주택유형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운영에 있어 주거요인을 반영해야 하는 근거와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함에도 난방유형에 따라 에너지빈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난방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료별 특성에 따라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름을 확인했다. 이는 에너지원에 따라 에너지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박광수(2019)와 김현경(2015)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개별난방2에 해당하는 연탄, 등유, 나무-석탄 보일러 이용자를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탄이나 등유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기나 가스를 이용 가구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바우처의 사업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석탄 정책 기조에 의해 연탄보조금 폐지, 등유 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이지혜, 2023). 이러한 맥락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탄, 석유, 나무-석탄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위험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들에 대한 바우처 금액 증대 또는 난방유형 교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지 못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러한 특성을 갖춘 가구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에너지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열, 방습 등의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김하나, 임미영, 2015; 김현경, 2015; 조윤재, 2019). 즉,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취약할 경우,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음에도 여전히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이나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작업(박미선 외, 2022)과 같은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에너지복지 제도가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 심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기로 앞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나의 실마리로서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에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의 단열 및 집수리 지원 사업은 참여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약 19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한국에너지재단, 2022). 이처럼 에너지이용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주택에 단열 및 창호 공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 이는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제도 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재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복지가 시행된 지 약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복지법은 부재하고, 종합적인 에너지복지를 위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여 에너지빈곤 측정 기준,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주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인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의 균형 잡힌 운영, 그리고 이들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주민의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의 연결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가 주거환경에 따라 에너지구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에너지복지의 정책방향으로 현금지원이 확대될 당시 에너지빈곤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에너지빈곤은 주거환경, 에너지비용 등 여러 요인이 상호적으로 얽혀 유발됨을 밝혀내곤 하였다. 그러나 막상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에 처하게 되는 요인으로서 주거환경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주거환경에 의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TPR 지표의 단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에너지빈곤층 중 에너지 저소비 가구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선 에너지바우처 이용자 중 에너지 저소비 가구의 에너지빈곤 영향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저소비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서비스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이때 국내에서 통용되는 TPR 측정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빈곤선을 사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에너지빈곤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으로 주택유형, 난방유형,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독립변수 중 주택의 물리적 환경은 에너지효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 외의 에너지효율 측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건물의 건축연도, 창문개수 등을 본 연구에선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나무-석탄 보일러가 포함된 개별난방2에서 기름보일러가 90%를 차지하여 관측값의 편중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에너지 효율성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지원 축소 등의 특성이 유사하다 판단하여 하나의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차원에서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을 고려하고, 각 난방유형에 대해 충분한 관측값을 확보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요소와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경험과 및 에너지바우처 이용 경험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에너지복지제도가 주거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로 점유형태 중 보증부 월세, 사글세 월세의 경우 자가인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 경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논의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나, 에너지바우처 이용자가 저소득 계층임을 고려할 때 월세를 납부하느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박광수(2018)는 다른 필수재 소비를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소비 박탈’ 상태에 놓이는 사례를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역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한 데 따른 왜곡된 양상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지역변수는 지역에 따라 에너지빈곤 경험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남수현과 박광수(2020) 주장과 같이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듯한 특성을 지녀 에너지빈곤 경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 지역의 기후요인,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요인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에너지빈곤 경험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연구모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료비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료비용은 에너지빈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특히 근래 국제 정세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연료비용 변동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난방연료의 가격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할 경우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 변동이 에너지빈곤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당시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이었으나 민간기관에 속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 산하 유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수행하게 되었다(진상현, 2020). 이후 2018년 한국에너지재단은 민간기관에서 산자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References
. (200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5.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2513
. (2021. 5).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195589002&rs=/docViewer/result/2021.08/13/195589002
. (2009).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사업평가. https://www.nabo.go.kr
.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195453
. (2023). 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 /economy/heri_review/1083324.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 ntent=2025010
, . (2023. 3. 4). 아파트 난방비가 한 달 새 2배 이상 올라 ... 고지서 받고 깜짝. 경향신문. https://m.khan.co.kr /economy/market-trend/article/20230120190703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 aring
. (2016).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3174&topic=
. (2023).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최대 90% 지원.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6295
. (2020. 12. 21). 20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참고자료]https://www.enet.or.kr/index.php?mid=press_release&document_srl=63666&ckattempt=1
. (2021).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70bb6cf/41/view
.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70bb6cf/44/view
. (2023. 1. 9). 연료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졌다…등유·LPG 가격 상승 탓. 경향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963.html
. (2023. 8. 31).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에너지재단 공공기관 해제 움직임. 경향신문. https://m.khan.co.kr/ 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311508011?utm_source=urlCopy&utmmedium=social&utm__campaign=s haring
, , . (2013).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분포 및 특성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s://www.keei.re.kr/library/10110/contents/6842486
. (2007). 난방시스템별 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한국에너지.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5
. (2023. 7).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https://www.sejong.go.kr/viewer/default/doc.html?fn=BBS_0000003889pWu7sz30.hwp&rs=/viewer/result/R0126
. (2023a).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 (2023b). 2배 더 따뜻한 겨울,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 https://www.energyv.or.kr
. (n.d). 에너지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202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백서. https://www.koref.or.kr
. (n.d).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https://www.koref.or.kr
. (n.d). 지역난방. https://www.kdhc.co.kr
, & (2024). Rented sector policies and measures report summary.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ject (ENPOR). https://ieecp.org/wp-content/uploads/2024/11/PRS-Policy-Analysis-Report-Summary-1.pdf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2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21

- 1274Download
- 290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