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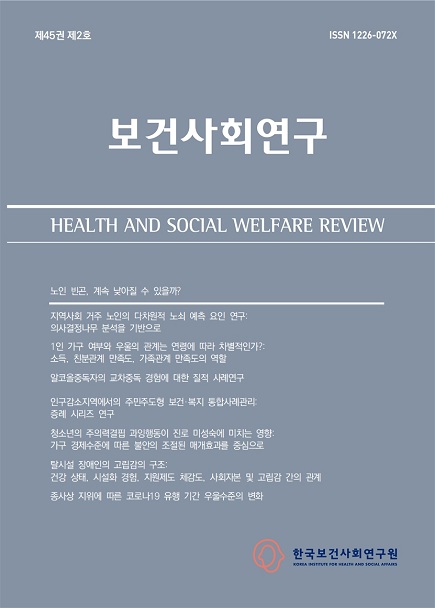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actors Related to Medication Adherence in Hypertensive Patients
Byun, Joonsoo1*; Ko, Tae-Joon2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582-600,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58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을 적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복약 순응도 관련 요인을 개인 차원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 차원까지 종합하여 조망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층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고혈압 환자의 공통적인 복약순응도 요인으로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동반질환(상태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 약제비부담/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이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특히, 보건의료체계 요인은 환자에게 교육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신념을 증진하여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들에 의한 개별적 건강신념을 강화하는 동시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이를 증대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actors influencing medic 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It categorizes these factors into five groups―patient factors, condition factors, therapy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system factors―based on the WHO multidimensional adherence model. The review included studies retrieved from RISS, KISS, DBpia, and PubMed, and the search, conducted in April 2024, was restricted to papers published after 2010. The key search terms included ‘hypertension’, ‘medication’, and ‘adherence’. Following quality assessment, 22 papers were selected for review. Most of these studies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the relevant factors. Common factors influencing medication adherence identified in the selected studies included: old age, health behavior, and self-effic acy (patient factors); comorbidities (condition factors); drug satisfaction (therapy factors); medication cost burden and city residency (socioeconomic factors);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s and 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health system factors). Notably, health system factors were shown to enhance medication adherence by reinforcing patients' health beliefs about the factors mentioned above through consistent instructions and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ing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requires strengthening patients’ beliefs about medication adherence and enhancing existing disease management programs.
초록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고, 해당 요인을 WHO 다면적 순응 모형에 따라 환자요인, 상태요인, 치료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PubMed에서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2010년 이후로 한정하였으며, 2024년 4월에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어로는 ① 고혈압, ② 복약, 복용, 투약, 약물치료, ③ 순응, 이행을 설정하였다. 문헌선정 및 질 평가 후, 총 22개 문헌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을 살핀 연구였다. 선정문헌의 공통적인 복약순응도 요인으로는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동반질환(상태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 약제비 부담/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체계 요인은 환자에게 교육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위 요인들로부터 파생되는 건강신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개별적 신념을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통해 이를 증대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론
근래에 한국은 인구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혈압은 2007년에 시작된 「심뇌혈관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대상이 될 만큼 대표적 만성질환이며, 대상이 된 두 질환 가운데 당뇨병보다 유병률이 높다. 실제로 고혈압의 유병률은 2023년 남성 23.4%, 여성 16.5%에 달하며, 당뇨의 남녀 각각 12.0%, 6.9%보다 높은 실정이다(질병관리청, 2023).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복약순응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추출된 항고혈압제 치료를 받는 성인 암 환자를 살펴본 연구에서, 복약순응도가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인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각각 1.72배와 1.71배 높게 나타났다 (Jung et al., 2023). 또한, 한국고혈압학회가 2021년에 출판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국은 20세 이상 인구의 28%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1,010만 명의 고혈압 진단자 중 치료를 준수하는 환자는 690만 명에 불과하여(Kim et al., 2022). 효과적인 고혈압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해외에서는 기존의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와 관련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최근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Dhar et al., 2017; Gutierrez & Sakulbumrungsil, 2021; Maleki et al., 2023; Ruksakulpiwat et al., 2024; Win et al., 2021). 해당 분석들에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다면적 순응 모형(Multidimensional Adherence Model, MAM)이 복약순응도 및 치료순응도 관련 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자주 적용된다(AlGhurair et al., 2012; Sabaté & Sabaté, 2003). 이러한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은 과거 연구들이 환자요인만을 다룬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당 모형은 생태적(ecological) 차원에서 여러 요인들을 개인 차원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 차원까지 다층적으로 종합하여 조망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는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층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Brown & Bussell, 2011).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해외의 학술적 경향과 정책판단에서의 용이성에 반해, 여전히 복약순응도와 관련된 개별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인 실정이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서 각 요인을 추출하고, 이들을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유승희, 강정희,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의 적응을 통해,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에 대한 다층적 종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할 작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WHO 다면적 순응 모형에 따라 분류하고 종합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 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지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WHO 다면적 순응 모형
본 연구에서는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을 활용하여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 WHO는 환자와 관련된 요인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AlGhurair et al., 2012; Sabaté & Sabaté, 2003). 해당 모형은 관련 요인을 환자요인, 상태요인, 치료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체계 요인의 총 5개의 부문(dimensions)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의 하위요인들을 AlGhurair et al.(2012)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WHO 다면적 순응 모형
| 환자요인 | 상태요인 | 치료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 보건의료체계 요인 |
|---|---|---|---|---|
| 자기효능감 | 우울증 | 부작용 발생 | 재정적 부담 | 의약품 리필의 어려움 |
| 복약에 대한 기억 | 의약품 포장을 여닫을 능력 | 복약 효능성 | 사회적 지지 | 보건의료체계 관련 문제 |
| 의약품 리필에 대한 기억 | 의약품 포장의 설명을 읽을 능력 | 복약 편의성 | 사회적 규범 | 정보의 부족 |
| 복약에 대한 낮은 관심 | 환자 위험인식에 대한 질병의 영향 | 의약품 요법의 복잡성 | 문화적, 언어적 장애 | 의료공급자의 지원 |
| 환자의 신뢰 | 증상의 심각성 | 빈번한 복용 변경 | 건강 문해력 | 치료에 대한 실용적 관점 |
| 환자의 태도 | 질병의 진행속도 | 기존의 치료실패 |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 약제비 청구 |
| 자의적 복약중단 또는 복약조절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 지원 | 의사 커뮤니케이션 및 환자 참여의 질 | ||
| 의약품 보장성에 대한 인식 | 의료공급자에 대한 접근성 | |||
| 환자의 지식 |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관계 | |||
| 비복약 시 결과에 대한 환자의 판단 | 진료예약의 어려움 | |||
| 복약순응 도움에 대한 인식 | 약국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
|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인식 | ||||
| 약사에 대한 환자의 인식 |
출처: “A systematic review of patient self‐reported barriers of adherence to antihypertensive medications us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Multidimensional Adherence Model”, AlGhurair et al., 2012, The Journal of Clinical Hypertension, 14(12), 877-886.
2. 건강신념모형
본 연구에는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HBM)을 통해, WHO 다면적 순응 모형에서 식별된 다층적 요인들로 구성되는 복약순응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된다. 먼저, 건강 신념모형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개인의 신념(individual belief)은 인지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인지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 인지된 이익(perceived benefit), 인지된 장애(perceived barrier), 인지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으로 구성된다.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은 각각 질병이 발생하거나 심화될 가능성과 그 질병이 가져올 개인의 삶에 미칠 심각성에 대한 신념이며, 이것은 인지된 위협으로 통합된다. 한편, 인지된 이익과 인지된 장애는 각각 건강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한 신념이다. 환자 개인은 단순히 인지된 위협이 커진다고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며, 인지된 이익과 장애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위협과 행동 가운데에서 작동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지된 자기효능감는 건강행동을 이끄는 확신 역할을 한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단서(Cues to action) 은 건강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Champion & Skinner, 2008). 실제로 HBM을 고혈압의 복약순응도에 0.25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인지된 장애와 자기효능감은 복약순응도를 유의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Al-Noumani et al., 2019).
그림 1
건강신념모형의 구성
출처: “The health belief model”, Champion & Skinner,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45-65.
3. 복약순응도 측정방법 및 도구
복약순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에는 심사청구자료를 활용하는 Cumulative Medical Adherence(CMA) 및 Medication Possession Ratio(MPR)와, 환자의 자가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리스키 도구가 있다. 전자는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후자는 환자의 자가보고를 사용하나, 둘 다 임상적, 생의학적 자료를 사용하는 직접측정이 아닌 간접측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행정자료로서 심사청구자료를 사용하는 CMA와 MPR은 보통 그 값이 동일하게 산출되지만, 세부적인 산출식과 함의는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CMA는 보통 환자가 의약품을 공급받고 다시 리필 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의약품이 공급된 누적일수로 계산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복약순응도를 의미한다. 그에 비해, MPR은 총 관찰기간 중 의약품이 공급된 일수의 비율로 계산된다(Hess,et al., 2006)
표 2
행정자료를 활용한 측정도구의 산출식 및 함의
| 측정도구 | 산출식 | 함의 |
|---|---|---|
| Cumulative Medical Adherence(CMA) | 의약품이 공급된 누적 일수/ 다음 의약품 리필 또는 관찰종료까지의 기간 | 누적기간 동안의 복약순응도 |
| Medication Possession Ratio(MPR) | 의약품이 공급된 일수/관찰기간 | 일정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비율 |
출처: “Measurement of adherence in pharmacy administrative databases: a proposal for standard definitions and preferred measures”, Hess et al., 2006, Annals of Pharmacotherapy, 40(7-8), 1280-1288.
한편, 모리스키 도구는 4-item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MMAS-4), 8-item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MMAS-8)이 주로 쓰이지만, 동기와 지식에 대해서 구별하여 질문하는 6문항의 Modified Morisky Scale(MMS)도 종종 쓰인다. 이들 중 MMAS-4는 4문항에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각 문항마다 총 0에서 4점을 매기며(Morisky et al., 1986), MMAS-8은 1-7번 문항에 예/아니오로 응답하고 8번 문항에 5점척도로 0.25점씩을 부가하여 총 0점에서 8점을 매긴다(Morisky et al., 2008).
이때, 모리스키 도구는 환자의 복약순응과 관련된 건강행동을 측정하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직접측정의 결과인 임상적, 생의학적 결과와는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심리측정(psychometrics)의 측면에서 문화와 맥락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화에서 복약순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추어 도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Tan et al., 2014).
III. 연구 방법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PubMed에서 검색하였다. 검색기간은 2010년 이후로 한정하였으며, 2024년 4월에 실시하였다.
국문 검색어는 ① 고혈압과 ② 복약, 복용, 투약, 약물치료 중 하나, ③ 순응, 이행 중 하나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영문 검색어는 국문에 대응하는 Mesh term인 "Hypertension"[Mesh Terms], "Medication Adherence"[Mesh Terms]를 사용하고, “Korea”[Mesh Terms]를 추가하여 검색문헌을 국내연구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문헌의 누락을 방지하였다.
문헌 선정은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선정과정에서 먼저 제목 및 초록으로 문헌을 선별하고, 이후에 전문을 검토해서 적격한 문헌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색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문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문선 선정기준은 PICO 기준 중 일부를 반영하여, ① 한국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opulation), ②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outcome), ③ 회귀분석을 실시한 양적연구 ④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문헌으로 두었다. 한편, 문헌 배제 기준은 ① 질적연구 및 종설, ②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로 설정하였다. 연구자 2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문헌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같이 재검토하였다. 질적연구를 배제한 것은 관련 요인과 복약순응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문헌을 선정한 과정과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우선적으로 168편의 논문을 획득하였으며, 그 중 Endnote 기능을 이용하여, 68편의 중복문헌을 제거하였다. 중복문헌을 제외한 100편의 문헌에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앞서 제시한 문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62편의 문헌을 배제했다. 이중에 원문확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남은 38편의 문헌은 전문을 검토하여, 문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4편의 문헌을 배제하고 총 24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그림 2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문헌 선정과정
출처: “The health belief model”, Champion & Skinner,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45-65.
이후에는 문헌의 질 평가를 Joanna Briggs Institute(JBI)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실시했다. 단면연구에 적용되는 8개 문항에는 표본선정 기준의 명확성, 연구참여자 및 설정의 구체성, 노출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상태측정 기준의 객관성/표준성, 통제변수의 정의, 통제변수 관리전략의 명확성, 측정결과의 타당성/신뢰성, 통계분석방법의 적절성이 포함된다. 준실험 연구에 적용되는 9개 문항에는 원인/효과의 명확성, 통제집단의 존재, 연구참여자의 동질성, 연구참여자 처치의 유사성, 측정결과의 다원성, 결과 측정방식의 동일성, 측정결과의 타당성, 추적관찰의 완결성, 통계분석 방법의 적절성이 속한다. 코호트 연구에 적용되는 11개 문항에는 집단의 동질성, 노출측정의 유사성, 통제변수의 정의, 통제변수 관리전략의 명확성, 초기시점의 결과와의 무관성, 측정결과의 타당성/신뢰성, 추적관찰의 충분성, 추적관찰의 완결성, 미완결 추적관찰 관리전략, 통계분석 방법의 적절성이 해당된다. 각 평가에서 4개 기준 이상 적합할 경우 문헌을 통과시켰다.
IV. 연구 결과
체계적 고찰을 통해 선정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연구는 총24편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전체 연구 중 2010-2014년에 출판된 논문 9편([1], [7], [9], [10], [14], [18], [21], [22], [24]), 2015-2019년 논문 8편([2], [4], [6], [11], [15], [16], [17], [20]), 2020-2024년 논문 7편([3], [5], [8], [12], [13], [19], [23])으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으로 구분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청구심사자료 및 표본-코호트 자료 연구 11편([2], [3], [4], [6], [7], [10], [11], [14], [17], [19], [22]), 한국의료패널 연구 5편([1], [12], [13], [15], [23]),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연구 3편([8], [20], [24]), 설문조사 연구 5편([5], [9], [16], [18], [21])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 연구는 주로 해외저널에 출판되었다.
표 3
선정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
| 번호 | 저자 | 연구설계 | 자료원 | 표본크기 | 연령특성 | 종속변수 명칭 | 종속변수 지표 |
|---|---|---|---|---|---|---|---|
| [1] | Cho & Kim (2014) | Logistic regression | Korean Medical Panel (2008-2009) | 5,324 | Over 65: 52.31% | Medication adherence | 1 item in the Panel |
| [2] | Choi et al. (2017) | Cox-proportional hazards model |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1-2013) | 20,067 | Over 65: 66.66% | Non-persistence |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 |
| [3] | Ghang & Lee (2023) | Multilevel analysis | General Health Screening data,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8-2021) | 214,066 | Over 60: 33.6% | Medication adherence | MPR |
| [4] | Han et al. (2017) | Logistic regressi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0.1-2011.6) | 662,170 | Mean age: 72.2 | Medication adherence | MPR |
| [5] | Jang et al. (2021) | PSM, DID | Four regional offices in each of the six metropolitan areas (2015.4-2015.11) | 12,140 | Over 60: 58.6% | Medication adherence |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
| [6] | Jeong et al. (2017) | Logistic regression | General Health Screening data,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2) | 65,919 | Over 60: 17.5% | Medication adherence | MPR |
| [7] | Kim et al. (2010) | Logistic regressi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4) | 2,454,844 | Over 60: 56.9% | Medication adherence |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
| [8] | Kim (2022) | DID | Community Health Survey (2018-2020) | 174,546 | Over 60: 70.2% | Medication adherence | 1 item |
| [9] | Park et al. (2013) | Logistic regression | Community Senior Center (2008-2009) | 241 | Over 65: 100% | Medication adherence | 16 items |
| [10] | Shin et al. (2010) | Logistic regressi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04.1.1.-2004.12.31) | 2,716,682 | Over 60: 56.9% | Medication adherence | CMA |
| [11] | Son et al. (2019) | PSM, DID |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base (2010–2014) | 5,370 | Mean age: 72.38 | Medication adherence | DPP* DDPP** |
| [12] | 길은하(2020) | 로지스틱 회귀 | 한국의료패널(2015) | 2,464 | 65세 이상 62.1% | 약물순응도 | 패널내 1개 문항 |
| [13] | 김계경, 유성 희(2020) | 로지스틱 회귀 | 한국의료패널(2017) | 3,627 | 평균연령 65.50세 | 약물 복용 이행 | 패널내 2개 문항 |
| [14] | 김성옥(2011) | 로지스틱 회귀 |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2000.7-2008.6) 대인면접조사 (2008.8.18-9.19) |
605 | 65세 이상 100% | 복약순응도 | Modified Morisky Scale(MMS) |
| [15] | 김성옥, 장선 미(2019) | 로지스틱 회귀 | 한국의료패널 (2008, 2009, 2011) | 1,804 | 65세 이상 61.5% | 복약순응도 | 패널내 1개 문항, MMAS-4*** |
| [16] | 김수정 외 (2019) | 로지스틱 회귀 | 8개 군병원(2018.7-8) | 149 | 60세 이상 2.2% | 복약순응도 | 4개 문항 |
| [17] | 김정애, 이의 경(2017) | 로지스틱 회귀 |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2010.1.1.-2013.12.31) | 약 1,200,000 | 60세 이상 51.2% | 복약이행도 | MPR |
| [18] | 김혜현, 이현 경(2010) | 로지스틱 회귀 | 9개 군병원과 1개 의무실 (2009.10.16.-11.30) | 202 | 평균연령 47.15세 | 복약이행 | MMAS-4 |
| [19] | 배민숙, 송현 종(2021) | 로지스틱 회귀 |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2018.2-2020.1) | 7,056 | 65세 이상 53.6% | 복약순응도 | MPR |
| [20] | 배상근 외 (2015) | 다항회귀 | 지역사회건강조사 - 경남서부 10개 시군 (2013) |
1,988 | 60세 이상 68.8% | 비의도적 비순 응, 의도적 비순응 | 6개 문항 |
| [21] | 서영미(2010) | 선형회귀 | J시 보건소 외래 (2008.1.9.-2.25) | 162 | 평균연령 64.76 | 약물치료 이행 | 3개 문항 (7점 척도) |
| [22] | 손경애 외 (2010) | 로지스틱 회귀 |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 2개도 지역내 전체 의 료기관 (2008.1-6) |
475,233 | 평균연령 62.4 | 투약순응도 | MPR |
| [23] | 전보영 외 (2023) | 로지스틱 회귀 | 한국의료패널(2018년) | 3,672 | 65세 이상 69.5% | 복약불순응 | 패널내 2개 문항 |
| [24] | 조은희 외 (2013) | 로지스틱 회귀 |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 (2008) | 1,291 | 평균연령 60.9 | 약물복용 이행 | 1개 문항 |
또한,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이 고혈압 유병자가 많은 60세 이상 노인이 아닌 연구는 4편 있었는데, 이들 중 2편([3], [6])은 국가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편([16], [18])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종속변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약순응도(medication adherence)는 번역어로 약물, 복약, 복용, 투약과 순응, 이행을 조합한 것이 많았다. 총 연구 중 한 편[2]은 치료 비지속성(treatment non-persistence)을 살펴보았고, 다른 한 편[20]은 비의도적 불순응군과 의도적 불순응군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복약순응도의 지표에 대해서 CMA/MPR 등을 계산한 연구, 자가보고 도구로 복약순응 여부를 판단한 연구로 문헌을 분류할 수 있었다. CMA/MPR 등의 의약품 공급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총 11편([2], [3], [4], [5], [6], [7], [10], [11], [17], [19], [22])이었다. 자가보고 도구 가운데 모리스키 도구가 3편([14], [15], [18])에 활용되었으며, 해당 도구는 MMAS-4, MMS로 구분되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자료원으로 이용한 연구 11편은 주로 CMA/MPR 등을 이용했다.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자료원으로 한 연구 총 8편은 모리스키 도구가 아닌 자료원 내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는데, 각 연구들은 같은 자료원을 사용하더라도 설문문항의 개수나 기준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에서는 비례위험모형 1편[2]만이 종단연구를 했으며, 나머지 23편은 횡단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연구 외에도, 다수준 모형 연구[3], 다항회귀(multi-nominal regression) 연구[20], 선형 회귀 연구[21]가 각각 1편씩 있었으며,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및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통해 인과성을 높인 연구가 3편([5], [8], [11]) 있었다.
선정문헌의 질 평가를 한 결과는 다음 <표 4>~<표 6>과 같다. <표 4>에서는 단면 연구의 질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21개 문헌 중 2편([16], [18])이 총점의 과반인 4점을 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표 5>와 <표 6>은 각각 준실험 연구([5], [8], [11])와 코호트 연구([2])에 대한 평가 결과이며, 총 4편의 문헌이 모두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위에서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편은 제외하였다.
표 4
단면 연구에 대한 JBI 체크리스트 결과
| 번호 | 표본선정 기준의 명확성 | 연구참여자 및 설정의 구체성 | 노출측정의 타당성/ 신뢰성 | 상태측정 기준의 객관성/ 표준성 | 통제변수의 정의 | 통제변수 관리 전략의 명확성 | 측정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 통계분석 방법의 적절성 | 합계 |
|---|---|---|---|---|---|---|---|---|---|
| [1] | O | O | O | O | O | O | X | O | 7 |
| [3]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4]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6]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7]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9] | O | X | O | O | O | X | O | O | 6 |
| [10]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12] | O | O | X | X | O | O | X | O | 5 |
| [13] | O | O | X | X | O | X | X | O | 4 |
| [14] | O | O | X | X | O | O | O | O | 6 |
| [15]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16] | X | X | X | X | O | X | X | O | 2 |
| [17]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18] | X | X | X | X | O | X | O | O | 3 |
| [19]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20] | X | X | O | O | O | O | X | O | 5 |
| [21] | X | X | O | O | O | O | X | X | 4 |
| [22] | O | O | O | O | O | O | O | O | 8 |
| [23] | O | O | O | O | O | O | X | O | 7 |
| [24] | O | O | O | O | O | O | X | O | 7 |
표 5
준실험 연구에 대한 JBI 체크리스트 결과
| 번호 | 원인/ 효과의 명확성 | 통제 집단의 존재 | 연구 참여자의 동질성 | 연구 참여자 처치의 유사성 | 측정 결과의 다원성 | 결과측정 방식 동일성 | 측정 결과의 타당성 | 추적 관찰의 완결성 | 통계분석 방법 적절성 | 합계 |
|---|---|---|---|---|---|---|---|---|---|---|
| [5] | O | O | X | X | X | O | O | O | O | 6 |
| [8] | O | O | X | X | O | O | O | X | X | 5 |
| [11] | O | O | O | O | O | O | O | O | O | 9 |
표 6
코호트 연구에 대한 JBI 체크리스트 결과
| 번호 | 집단의 동질성 | 노출 측정의 유사성 | 통제 변수의 정의 | 통제변수 관리 전략의 명확성 | 초기 시점의 결과와의 무관성 | 측정 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 추적 관찰의 충분성 | 추적 관찰의 완결성 | 미완결 추적관찰 관리전략 | 통계 분석 방법 적절성 | 합계 |
|---|---|---|---|---|---|---|---|---|---|---|---|
| [2] | X | O | O | O | X | O | O | O | O | O | 9 |
선정 문헌에서 보고한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WHO의 모형에 따라 환자요인, 상태요인, 치료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환자요인에서는 고령([1], [3], [6], [10], [17], [22], [23], [24]), 금주([6], [12], [15]), 금연([12], [24]), 운동([4], [9], [15]), 자기효능감 및 자율적 동기([20], [21])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상태요인에서는 동반질환([2], [6], [10], [22], [23], [24])이 공통적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였으며, 치료요인에서는 약물만족도([12], [13])가 작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약제비부담([12], [13])과 도시거주([3], [10])가 대부분 복약순응도를 높였고, 의료급여는 2편([2], [24]) 에서 복약순응도를 높였으나 3편([2], [3], [22])에서는 낮추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보건의료체계 요인에서는 대체로 만성질환관리사업(Disease Management Program, DMP)([11], [17], [19])과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Patient-Provider Communication, PPC)([13], [14], [15])이 복약순응도를 높였다.
표 7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 연구 | 하위집단 | 환자요인 | 상태요인 | 치료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 보건의료체계 요인 |
|---|---|---|---|---|---|---|
| [1] | 고령(+) | 교육수준(+) | ||||
| [2] | 성인 | 이상지질혈증(+) | 의료급여(-) | |||
| 노인 | 이상지질혈증(+) | |||||
| 고령노인 | 동반질환지수(+), 치매(+), 이상지질혈증(+) | 의료급여(+) | ||||
| [3] | 고령(+) | 의료급여(-), 도시(+), | 고혈압 검진(+) 의료기관 급(-) | |||
| [4] | 허리둘레(-), BMI(+), 흡연(-), 운동(+) | |||||
| [5] | 전화사례관리(+) | |||||
| [6] | 고령(+), 가족력(+), 음주(-), BMI(+) |
고혈압단계(+) | 의료기관 첫 방문 소요기간(+) |
|||
| [7] | 불안장애 등(+) 우울장애 등(-) |
|||||
| [8]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의사-환자 인센티브(-) |
|||||
| [9] | 복약순응적 라이프스타일*(+) | 메타 기억력(+) | 고용(+) | |||
| [10] | 일반인구 | 고령(+) | 동반질환(+) | 약물복용 기간(-) | 직장건강보험(+) 도시(+) | |
| 암 생존자 | 고령(-) | 도시(+) | ||||
| [11]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 |||||
| [12] | 흡연(-) 음주(-) | 약물복용 기간(+) 부작용 발생(-), 약물만족도(+) |
약제비부담(+) | |||
| [13] | 약물만족도(+) | 약제비부담(+) | 의사와의 대화(+) | |||
| [14] | 처방의약품수(+) | 도시(-) | 약사의 상담(+) | |||
| [15] | 음주(-), 운동(+) | 동반질환(-) | 도시(-), 소득(-) | 의사의 설명(+) | ||
| [17] | 고령(+)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 ||||
| [19]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연간교육횟수(+) 연간 환자관리횟수(+) |
|||||
| [20] | 비의도적 비순응 | 우울감(-), 관절염(-) | ||||
| 의도적 비순응군 | 자기효능감(+), 필요성 신념(+), 염려 신념(-) | 심뇌혈관질환(-) | ||||
| [21] | 유능감(+), 자율적 동기(+) | 건강상태(-) | ||||
| [22] | 고령(+) | 심장질환(+),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 의료급여(-) | 외래진료횟수(+) 의료기관 급(+) |
||
| [23] | 고령(+) | 동반질환지수(+) | ||||
| [24] | 고령(+), 흡연(-) | 동반질환지수(+) | 배우자(+), 의료급여(+) |
이를 통해, 복약순응도가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을 종합해보면,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동반질환(상태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 약제비부담/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 둘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을 WHO 다면적 순응 모형 각 요인의 세부항목과 매칭을 해보면, 자기효능감은 그 자체, 고령/건강행동은 환자의 태도/지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동반질환은 증상의 심각성, 약물만족도는 복약 효능성과 연관있다. 약제비부담과 도시거주는 각각 재정적 부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리고 두 가지 보건의료체계 요인은 주로 의사 커뮤니케이션 및 환자 참여의 질과 보건의료체계 관련 문제와 연결된다.
V. 연구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WHO 복약순응 모형에 따라 해당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이때, 선정된 문헌은 총 24편이었으며, JBI 질 평가를 통과한 논문은 2편을 제외한 총 22편이었다. 자료원으로 연구를 구분하면, 국민건강보험 청구심사자료 및 표본-코호트 자료 연구 11편, 한국의료패널 연구 5편,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연구 3편, 설문조사 연구 3편이 있었다. 질 평가가 이루어진 선정문헌 중 국민건강보험 자료 연구는 주로 해외저널에 출판되었다. 이것은 해당 연구 7편이 JBI 체크리스트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연구의 질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료패널 연구 5편 중 4편이 2015년 이후 논문이었다. 이것을 보아 한국의료패널이 200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연구의 질 평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2편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고혈압 환자 군인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었던 점이 작용하였다.
선정문헌은 복약순응도의 지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CMA/MPR 등을 산출한 연구, 자가보고 도구로 복약순응 여부를 살핀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CMA/MPR 등의 의약품 공급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총 11편, 자가보고 도구 가운데 모리스키 도구를 활용한 연구 2편이 있었다. CMA/MPR 등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자료원으로 이용했는데, 이는 해당 자료에 처방조제가 기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리스키 도구가 아닌 자료원 내 설문문항을 이용한 연구 8편은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자료원으로 하였다. 해당 자료원이 널리 쓰인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복약순응도 판단에는 모리스키 도구와 같은 검증된 설문이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정문헌의 연구설계에서 비례위험모형 1편만이 종단연구였으며, 나머지 21편은 단면연구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연구 시에 고혈압 환자 집단의 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연구 가운데,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분법을 통해 인과추론을 실시한 연구가 3편 있었다. 해당 연구들은 모두 JBI 질평가에서 통과하였으며 해외저널에 출판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법이 사용된 것은 이들이 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서의 제도의 변화가 고혈압 복약순응도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 정책적 개입과 같은 보건의료체계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PSM 및 DID를 이용하여 연구의 인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선정문헌에서 복약순응도를 높인 공통적인 요인을 종합해보면,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동반질환(상태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 약제비부담/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이 있었다. 이들을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의 각 요인의 세부항목과 매칭을 해보면, 자기효능감은 그 자체, 건강행동은 환자의 태도에 상응한다. 동반질환은 증상의 심각성, 약물만족도는 복약 효능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약제비부담과 도시거주는 각각 재정적 부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연결된다. 의료공급자-환자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각각 의사 커뮤니케이션 및 환자 참여의 질과 보건의료체계 관련 문제와 관련성을 보인다. 종합적으로는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환자요인부터 보건의료체계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복약순응도 향상 정책이 다층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이때, WHO 다면적 순응 모형의 세부 요인에 비해 선정문헌에서 찾아낸 주요한 관련 요인이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으며 그 수도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해당 모형을 이용하기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책적 개입 요인의 영향을 주로 살피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정문헌에서 일부 해석이 필요한 복약 순응도 관련 요인이 있다. 먼저, 고령인 경우에 복약순응도가 대체로 높았는데, 이는 고령자의 경우에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신세라, 2021). 다음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할 경우에 복약순응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각각 나타났다. 이것은 의료급여를 수급 시에 의료비부담이 주는 반면, 의료급여가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지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14). 또한, 약제비부담은 그것이 높을수록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오히려 높였는데, 이는 약제비 수준이 환자가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을 증대시켜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김계경, 유성희, 2020). 그리고 선정논문 [8]에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복약순응도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해당 연구가 PSM을 통해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DID를 실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연구는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공통적 요인을 WHO 다면적 순응 모형에 따라, 환자요인, 상태요인, 치료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는 다층적으로 제시된 이들 요인들을 건강신념모형에 재적용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건강신념모형이 제시하는 주요한 개인의 신념(individual belief)은 인지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인지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 인지된 이익(perceived benefit), 인지된 장애(perceived barrier), 인지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으로 구성된다.
복약순응도 요인들을 개인의 신념에 매칭할 시에, 고령/건강행동/자기효능감(환자요인), 약물만족도(치료요인)은 자기효능감, 동반질환(상태요인), 약제비부담(사회경제적 요인)은 인지된 위협, 도시거주(사회경제적 요인)은 인지된 장애와 연관된다. 한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만성질환관리사업(보건의료체계 요인)은 환자에게 일관된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신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환자관리는 임상수치 확인, 환자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에는 투약 격려, 생활습관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4). 또한, 국외에서도 무작위배정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서도 건강신념모형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Khorsandi et al., 2017; Yazdanpanah et al., 2019). 이를 통해, WHO 다면적 순응 모형과 건강신념모형을 종합할 시에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환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한 지침수립 및 교육은 주로 환자 개인수준에서 구성되는 자기효능감/인지된 위협과 사회구조 수준에서 구성되는 인지된 장애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 중 하나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발맞추어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Tucker-Brown et al., 2024). 한국에서는 「심뇌혈관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2007년에 시작한 이래로 해당 사업이 확장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구본미, 도영경, 2024; 김남희, 2018).. 한편, 환자-의료공급자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해당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업에 대한 환자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사업에 참여하는 확률이 낮아진 반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도입가정하여 그 금액을 높일수록 참여확률은 더 높아졌다(구본미, 도영경, 2024).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국에서는 처방전을 받고 진료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되어, 교육, 검사결과 설명, 상담만 진행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거부반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송은주 외, 2021). 이에 따라, 향후에 환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진구, 2007).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의료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수용성이 낮거나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폐지되거나 사업내용이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신규수가 또는 수가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김교현 외,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앞서 제시했던 고혈압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에 체계적 문헌고찰 선행연구와 비교 평가를 해볼 수 있다. Dhar et al.(2017), Gutierrez & Sakulbumrungsil(2021), Maleki et al.(2023), Win et al.(2021)은 WHO 다면적 순응도 모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환자요인, 상태요인, 치료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체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모범적으로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har et al.(2017), Gutierrez & Sakulbumrungsil(2021), Ruksakulpiwat et al.(2024), Win et al.(2021)은 양적연구뿐 아니라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선정문헌에 포함하여 더 풍부한 자료들을 고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과 복약순응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에서의 관련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최근 연구들은 보건의료체계가 정착한 고소득국가가 아닌 필리핀(Gutierrez & Sakulbumrungsil, 2021), 이란(Maleki et al., 2023), 개발도상국(Dhar et al., 2017) 등의 중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고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한국대상으로 처음으로 고혈압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 체계적 문헌고찰이 실시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들이 자료원의 크기가 다르고 복약순응도를 판정하는 데에 각자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의 결과들을 동등하게 보기 힘들다. 특히, 기존 패널 및 조사자료를 자료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2개의 문항으로 복약순응도를 판정하므로 타당성과 신뢰성 수준이 낮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을 대체로 인과성을 확보하지 못한 방식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점에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향후에는 DID 및 PSM 등을 사용한 연구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련 요인에 대해서 체계적 고찰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별 연구의 특성을 살피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지점들을 살필 수 있었고, 다음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References
, , , , , & (2019). Health beliefs and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02(6), 1045-1056. [PubMed]
, , , & (2006). Measurement of adherence in pharmacy administrative databases: a proposal for standard definitions and preferred measures. Annals of Pharmacotherapy, 40(7-8), 1280-1288. [PubMed]
, , , , , & (2023). Factors related to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in Iran: a systematic review study. Blood Pressure Monitoring, 28(5), 221-235. [PubMed]
, , & (1986). Concurr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self-reported measure of medication adherence. Medical Care, 67-74. [PubMed]
[선정 문헌]
, &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nonadherence to antihypertensive medication. Nursing & Health Sciences, 16(4), 461-467. [PubMed]
, , , & (2017). Health Behaviors and Medication Adherence in Elderly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31(4), 278-286. [PubMed]
, , , , , & (2021). Assessment of a medication management program targeting hypertension and diabetes patients: Impact on medication adherence. Research in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17(2), 419-427. [PubMed]
, , , & (2010). Differences in adherence to antihypertensive medication regimens according to psychiatric diagnosis: results of a Korean population-based study. Biopsychosocial Science and Medicine, 72(1), 80-87. [PubMed]
(2022). Effect of primary care-level chronic disease management policy on self-management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in Korea. Primimary Care Diabetes, 16(5), 677-683. [PubMed]
, , , & (2013). Predictors of adherence to medication in older Korean patients with hypertension.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12(1), 17-24. [PubMed]
, , , , , , & (2010).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dherence in cancer survivors and its affecting factors: results of a Korean population-based study. Support Care in Cancer, 19(2), 211-220.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3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2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30

- 932Download
- 3041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