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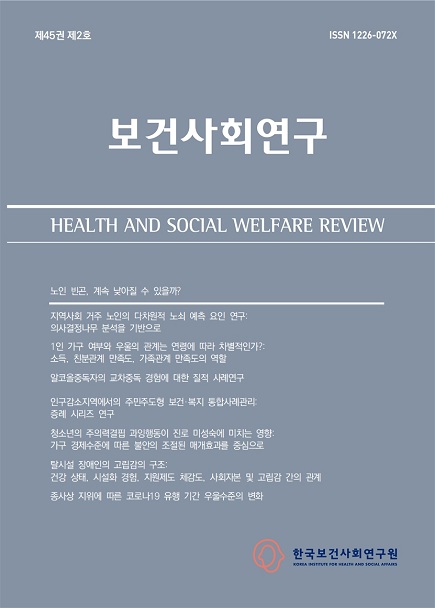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검토: 만성질환의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Reconsidering the Boundaries of Disability Categories in South Korea: The Inclusion of Chronic Illness
Mun, Yeongmi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601-623,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60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의 확장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법적 장애인 범주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만성질환자의 장애 등록을 인정한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장애인복지체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신체적‧사회적 제약을 장애 판단의 요소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최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적 장애인 범주를 기능적, 사회적 제약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장애 범주의 실질적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 질환 목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는 한편, 장애 판단 기준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범주의 확대가 단순한 수급자 증가가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장애 경험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포괄성과 정당성 확보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curren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ictly defines disabi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which results i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with certain chronic illnesses from the disabilit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disability welfar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define disability based on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y have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including certain chronic illnesses within the scope of disability. An analysis of domestic court rulings on disability recognition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s primarily been driven by individual legal disputes. Since the 2010s, Korean courts have increasingly interpreted the list of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Act as an illustrative guideline rather than an exhaustive enumeration, signaling a shift toward assess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al consensus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caused by an increase in welfare recipients, and that gradual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장애 범주의 확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결과, 장애 범주가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질환 목록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정 기준을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지 수급 대상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Ⅰ. 문제 제기
한국에서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 항의 정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제2조제2항에서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을,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구분되며 외부신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성된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구성된다.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상술한 15개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다수의 복지 제도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한국 장애인의 정의는 선언적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 특정 장애판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소한 의학적 정의가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황수경, 2004). 예컨대 장애등록심사 법령에 따르면 지체장애 중 하지 절단장애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에 “두 다리를 무릎관절/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기준을 명시하나, 여전히 지능지수가 하나의 근거로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 즉 「장애인복지법」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장애 범주는 의료적 근거로 판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는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한국의 장애 범주 기준의 협소함은 기능적 장애의 개념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정하는 다른 국가의 수치가 비교할 때 분명히 확인된다.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는 “정서, 인지, 인간관계, 이동, 고통, 수면과 에너지, 신변처리, 시력” 기능의 제약을 기능적 장애로 정의하며 전세계 장애출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5.6%가 장애 인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WHO, 2011, pp. 74-76). 한편 미국에서도 역시 청력, 시력, 인지, 이동, 자기관리(self-care), 자립생활 등 6개의 기능 영역의 제약으로 장애 인구를 추정하며 18세 이상 인구의 25.7%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Okoro et al., 2018). 기능의 제약으로 장애를 추정하는 국제 수치와 비교할 때 국내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2) 특정 유형의 질병이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넓은 범주에서 장애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시됨에 따라(박병배 외, 2013) 장애인정의 범주도 차츰 확장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의 정의는 1988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도입한 장애인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지만 장애인으로 정의되는 집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88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여 5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장애인을 협소하게 규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장애인 범주의 단계적 확대가 진행되었다. 2000년 1단계 유형 확대 기간에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이 포함되었고, 2003년 2단계 범주 확대에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008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이 포함되고, 정신지체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를 제외한 발달장애인이 자폐성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현재와 같은 15개의 장애 유형을 구성하게 되었다(조윤화 외, 2022, p. 28).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등급이 6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범주의 정의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암, 혈액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을 가진 질환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박병배 외, 2013). 2021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간장애 합병증, CRPS, 백반증, 중증복시, 배뇨장애, 뚜렛증후군 등을 장애인정 질환에 포함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11,778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보건복지부, 2020. 12. 31.), 실제 등록 현황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22년 기준 투렛장애 환자는 13,143명이고 2021-2022년 투렛장애 등록 신청자는 129명이지만 최근 치료 기록 의무 및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이 중 95명만이 장애 판정을 받은 걸로 보고되었다(김정수, 2024. 5. 30.).
여전히 한국의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비판도 향후 장애 범주를 계속하여 확장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차 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UN Committee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2014). 또한 UN CRPD 이행상황에 대한 2019년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 정의가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HIV/AIDS가 있는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UN CRPD, 2019). 따라서 향후 장애 정의를 사회적 모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HIV/AIDS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 내에 포섭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정 질환 확대를 포함한 2021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심사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12. 31.).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의 제약으로 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서도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향후 더 다양한 만성질환자들이 법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 제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장애 범주 확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외의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를 살펴보고 만성질환을 장애로 인정한 국내의 판결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구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법적 혜택을 받는 장애인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별 만성질환자의 장애 등록을 인정한 판결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장애 범주를 확장하여 한국 장애인 복지체계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장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장애와 만성질환의 관계: 의료사회학과 장애학적 관점
1950년대 의료사회학자들은 일탈 이론(deviant theory)을 토대로 장애인과 질환자 등 사회적으로 일탈된 존재들의 존재를 다루어왔다. 즉 장애인은 사회에서 일탈한 존재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구조적 기능주의 하에서 급성과 만성질환은 사회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의료적 전문가에 의하여 교정되어야 하는 종류의 것이었다(Thomas, 2010, p. 39).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1960년대에 와서 Goffman 등의 의료사회학자들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신질환자나 물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흔히 만성질환과 장애의 사회학(Sociology of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Sociology of CID)이라고 불리는 학문분야에서는 장애 혹은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sufferer)이 장애와 질병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고, 장애와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의료 전문가와 재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Thomas, 2010). 특히 Bury(1982)는 만성질환이 개인의 삶에서 ‘전기적 단절(biographical disruption)’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질병과 장애 경험이 단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닌 사회적·정체성적 경험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질병과 장애가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료사회학 내부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의료사회학자들은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유사한 단계인, 스트레스, 위기, 상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Livneh & Antonak, 2005). 이와 같은 심리정서적 기제에 대한 개인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회피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려는 행동이며(disengagement coping strategy), 다른 하나는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 해결하며, 사회적 지원을 모색하려는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목표 지향적 행동(engagement coping strategy)이다(Livneh & Antonak, 2005). 장애와 만성질환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다루는 의료사회학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장애물과 무관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더 넓은 사회구조에서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Thomas, 1999). 그러나 Bury 이후의 의료사회학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낙인이론, 자아정체성 이론 등을 통해 질병과 장애를 겪는 주체의 경험과 사회적 의미 구성에 주목하며, 장애학과 상호보완적인 지점들을 형성해왔다. 또한 의료사회학의 관점에서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료전문가의 통제 하에서 자신의 장애와 질병을 관리하여야 했는데, 이것은 자기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억압을 조장할 수 있다. 장애학자들이 의료사회학을 비판하는 주요한 쟁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Rosqvist et al., 2017).
한편 1970년대 영국 등에서 시작된 장애운동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의료사회학의 관점과 선을 그으며 장애의 의료화에 대한 반대를 핵심적 이념으로 성장해왔다. 장애학이 의료사회학의 관점과 분리되는 지점은 두 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장애에 대한 개입이 전적으로 의료전문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와 질병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의료화에 대한 반대는 영국의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의 선언문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우리 연합은 의료 또는 다른 전문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거나, 우리에게 정보를 통제하거나, 우리의 등 뒤에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료화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였다(UPIAS, 1976, p. 18). 장애운동가들이 ‘사회적으로’ 일탈된 존재들의 개인적 고통이나 심리사회적 적응만을 강조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되는 장애라는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장애인의 행위주체성(agency)을 과소평가하고 운명에 그저 적응하는 모습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사회학의 관점을 비판하였다(Thomas, 2010).
한편 장애와 만성질환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개념화를 거부하며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고수하였다. 일례로 Crow(1996, p. 209)는 은 “만성질환(chronic illness)과 같은 질병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이나 억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mundson(1992, p. 114)도 역시 “아픈 사람들과 달리 장애인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무능력하지(globally incapacitated)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병과 장애를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료 사회학 분야에서 장애인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만연한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편견, 장애인의 아픈 사람으로서의 역할(sick role), 즉 질병을 회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멀어지기 위해서이다(Amundson, 1992). 마지막으로, 에이즈나 암과 같은 질병이 갖는 낙인을 장애의 낙인에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Gill, 1994, Wendell, 1996/2013, p. 56에서 재인용).
따라서 장애와 만성질환의 경계 문제는 소홀히 여겨져 왔다. 장애가 온전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제라면 ‘장애’의 개념에 만성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의료사회학의 관점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건하게 고려할 때에도 사회적인 장애물을 없애고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를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다른 주제에 분산시키는 일일 수 있다(Shakespeare, 2006/2013). 초기 장애운동가들은 장애는 사회적 장벽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이라고 보았으므로 사회적 제약들이 제거된다면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장벽들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만성질환 경험에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의료화와 연관될 우려로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 개념화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장애학자인 Susan Wendell은 비판을 제기한다. Wendell(1996/2013)은 근육통성 뇌척수염이라는 만성질환을 여성으로 직접 경험한 사회적 제약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질병을 가진 사람과 달리 장애인이 환경적 제약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다는 Amundson(1992)의 주장을 반박한다. 먼저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도 사회적 영향으로 인하여 제약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Wendell은 정상적인 속도를 요구하는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해질 수 밖에 없는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아픈 사람들이 (장애인과 달리) 전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비판에도 반박한다. 많은 경우 만성질환자들이 사회적 활동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질병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이미지에서 오는 것이며, 사회적인 제약이 제거되었을 때 질환자들도 자신의 속도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Wendell(1996/2013)은 만성질환자의 경험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만성질환의 자리가 존재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애 범주에 만성질환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신체적 조건성과 사회적 구조의 교차점에서 장애를 재개념화하자는 이론적 제안으로 볼 수 있다. Wendell의 논의는 특히 ‘정상적인 신체’와 ‘완전한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어떻게 질병과 장애를 주변화시키는지를 비판하며, 건강 개념의 규범성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장애학은 장애를 사회적 장벽에 의해 구성된 현상으로 정의하며 의료화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만성질환 역시 사회적 제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며 장애와 만성질환의 관계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와 만성질환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의료화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포괄함으로써 장애와 관련된 정책과 담론의 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만성질환 경험과 장애 경험은 모두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두 경험의 공통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담론적 틀이 요구된다.
2. 장애와 만성질환의 관계: ICF 모델의 적용
1970년에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가 장애를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하기 전까지 장애와 질병의 개념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이한나, 2012, p. 27). 1970년 개발된 ICIDH가 1980년 WHO에 의하여 공인되며 장애는 ICIDH 개념틀에 의해 설명되기 시작한다. ICIDH에서 장애는 병리학적 변화로서 개인의 비정상적 ‘건강상태’에서 기인한다. 비정상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차원의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손상은 활동상의 능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개인적 차원의 ‘장애’로 이어지고, 장애는 곧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에 대한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불리’로 이어진다(WHO, 1980). 즉 장애와 사회적 불리는 개인의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기인하지만, 명백히 구분된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ICIDH가 장애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European Commission, 2003, 황수경, 2004, p. 131에서 재인용). 첫째, 장애인이 가진 손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ICIDH는 건강상태로부터 손상이, 손상으로부터 장애가, 장애로부터 사회적 불리가 기인한다고 보는 단선적 원인론을 채택하였다. 장애운동가들은 ICIDH가 장애의 원인을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서 찾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hakespeare, 2006/2013). 손상이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혹은 손상과 무관한 건강 문제가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CIDH의 모델은 이와 같은 역인과성과,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요인과 건강요인의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둘째,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등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가 무능력을 의미한다는 관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라는 현상은 제도 내에서 ‘장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문제를 특정한 소수자 집단의 문제로 가정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장애, 사회적 불리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등의 중립적 용어로 교정하고, 한 방향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ICIDH-2가 1997년 제안되었다. 이는 2001년 장애와 건강에 대한 개념적 틀로 WHO가 채택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전신이 되었다.
ICF는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기능과 장애’ 영역과 ‘배경요인’ 영역을 나누어 설명한다. 건강상태는 이 두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기능과 장애’ 영역은 다시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 ‘참여’로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배경요인’은 기능과 장애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상태를 구성한다고 가정되는 요인으로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으로 다시 분류된다(WHO, 2001; 통계청, 2010). ICF 모델에서 장애는 고정된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는 건강조건을 지닌 개인에 의해 경험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생활영역 속에서 신체, 개인, 혹은 사회 수준에서의 기능하는 어려움”(WHO, 2001, p. 9)으로 정의된다.
ICF는 ICIDH의 틀을 넘어서 건강과 질병, 장애의 관계에 있어 개인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통계청, 2010).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ICIDH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지며 장애와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선적 원인론에서 벗어나서 ‘기능과 장애’, ‘배경요인’의 하위 요인들이 건강상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이다. 질병과 신체이상으로부터 손상을, 손상으로부터 장애를, 장애로부터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과 활동제한, 참여제약이 상호작용하며 기능과 장애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손상을 장애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상태를 구성한다고 본다.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뿐 아니라 환경요소나 개인요소에 따라 개인에게 장애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ICF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장애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고 건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2010, p. 2). 이러한 가정을 통해 제도 내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나 기능적 장애를 경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이 모두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Reichard et al., 2014). 따라서 ICF를 활용해 기능적 장애를 경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건강문제로 포괄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Ⅲ. 국외 사례 검토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의 한계를 조망하고 제언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장애 관련 법제에서의 장애 정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각국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제도적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 가운데, 복지급여,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자격 등 행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대상에는 인권법적 성격을 띠면서도 차별 보호의 기준이 되는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복지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SI), 그리고 복지서 비스와 혜택 제공의 기준이 되는 독일의 「사회법」 제9권(SGB IX) 및 일본의 「장해자종합지원법」을 포함하였다. 이들 국가는 사회·법문화적 차이는 있으나, 기능적 제약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보다 포괄적 장애 범주 설정을 통해 다양한 질환과 상태를 제도적 지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1. 영국 「평등법」(Equality Act)에서의 장애 정의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보편적인 장애인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의 판정 기준으로 장애를 규정하지 않지만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장애 기준이 존재한다. 「평등법」 제4조에는 보호받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6조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disabled people)으로 규정된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평등법」상 장애는 “일상생활을 하는 능력에 ‘현저하고’,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한다. 규정에서는 ‘현저함’과 ‘장기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현저함’이란 일상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장애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이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활용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전기 제품과 문단속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은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첫 발병 시점부터 지속되는 총 기간이 최소한 12개월 이상일 가능성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남은 인생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11).
영국의 「평등법」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장애 범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인 암, AIDS/HIV 감염,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등은 「평등법」상 장애로 인정된다. 또한 그 자체로 장애로 여겨지지 않지만, 질환의 영향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현저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면 장애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출증, 관음증 자체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지만, ADHD 환자의 증상이 노출증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현저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준다면 장애로 인정된다.
영국 「평등법」상에서는 장애로 인정되는 상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상으로 간주되는 전체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11, p. 8). 의학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목록이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 「평등법」의 장애 정의는 한국 장애인복지법과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특정한 의학적 상태나 손상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반면, 영국 「평등법」은 장애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그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의학적·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미국은 사회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거의 모든 분야의 장애를 포괄하도록 신체 주요 기관계통 및 기능 영역별 14개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근골격계 장애(Musculoskeletal Disorders), ② 감각 및 언어 기능 장애(Special Senses and Speech), ③ 호흡기계 장애(Respiratory Disorders), ④ 심혈관계 장애(Cardiovascular System), ⑤ 소화기계 장애(Digestive Disorders), ⑥ 비뇨생식기계 장애(Genitourinary Disorders), ⑦ 혈액 장애(Hematological Disorders), ⑧ 피부 장애(Skin Disorders), ⑨ 내분비 장애(Endocrine Disorders), ⑩ 선천성 다발성 장애(Congenital Disorders affecting Multiple Body Systems), ⑪ 신경계 장애(Neurological Disorders), ⑫ 정신장애(Mental Disorders), ⑬ 암 및 종양(Cancer, Malignant Neoplastic Diseases), ⑭ 면역계 장애(Immune System Disorders)로 구분하고 있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a)). 이 규정은 신체 각 기관계와 정신건강 전반을 망라하는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범주마다 의료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장애 범주는 특정 진단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이러한 광범위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어떤 질환이든지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위 범주 중 하나에 속하고 동시에 노동능력 상실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급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이나 희귀질환도 해당 질환이 신체 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하면 면역계 장애 또는 다른 관련 범주로 인정받아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SSA는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질환의 의학적 명칭보다 그로 인한 기능장애의 정도에 주목하므로, 특정 질환이 SSA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장애가 동등한 중증도를 가진다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규명되는 질환이나 복합 장애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n.d.(b)).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미국에서 상당한 인구가 사회보장 장애급여인 SSI나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를 수급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18-64세 인구 약 1,100만 명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5.4%에 해당한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2). 이 통계에는 아동 및 노인 연령대의 장애급여 수급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 연령대로 보면 장애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은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의 「사회법」(Neunten Sozialgesetzbuch)에서의 장애 정의
독일의 「사회법」 제9권(Sozialgesetzbuch IX, SGB IX)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태도 및 환경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6개월 이상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장애를 정의하여 역시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Sozialverband VDK, 2018). 독일에서 장애의 정도는 장애의 심각도를 양화한 정도(GdB)로 규정하고 있다. GdB는 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GdB가 50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직장 해고 방지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GdB가 30 이상인 노동자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독일의 「사회법」에서는 심각한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장애로 인정한다. 이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치료 수준이 높거나 장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질병이 악화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 발병하는 심각한 편두통의 경우 GdB가 50-60일 수 있으며, 만성 궤양성 대장염 역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 50-60, 염증 활성이 강한 만성간염의 경우 GdB가 50-70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중증장애로 인정된다(Sozialverband VDK, 2018).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만성질환의 장애 인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인 C-335/11, C-337/11의 영향을 받았다(InfoCuria, 2013). 이 판결은 덴마크에서 각각 요추 통증 및 목뼈 무상으로 길게 병가를 낸 후 해고를 당한 두 노동자의 장애 차별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11년 덴마크 상업해사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3년 4월 11일에 내려졌다. 이 소송의 핵심은 특정 만성질환이 장애차별법상 ‘장애’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관한 논쟁이었다. 법원은 해당 병가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아, 즉 고용주가 장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유럽 사회에서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 차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4. 일본의 장해자종합지원법상 난치병 기준
일본에서 2012년 제정된 「장해자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援法)」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정의에 ‘난치병 등(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는 질병 그 밖에 특수한 질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도인 자)’이 추가되었다(일본 후생노동성, 2023).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해자종합지원법」 제4조(정의)에서는 “이 법 있어서 ‘장해자(障害者)’라 함은 「신체장해자복지법(⾝体障害者福祉法)」 제4조에 규정된 신체장해자, 「지적장해자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에 있어서 지적장애인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에 관한 법률(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제5조제1항의 정신장해자를 말한다. (중략) 장해자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질병 기타 특수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자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치병 환자 등 「장해자종합지원법」상 장해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자 수첩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장해자종합지원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장해자 수첩(障害者⼿帳)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발급되는 공적 인증서로, 이를 소지한 경우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세제 혜택, 교통 할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공영종, 2025).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기존에 난치병 환자 등의 지원이 재가생활지원사업의 재가서비스(홈헬프서비스, 단기입소, 일상생활용품급여)에 국한 되었던 데에서 나아가,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일본 후생노동성, 2023).
구체적인 ‘난치병 등’의 범위는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특수한 질병(「장해자종합지원법」 시행령 제6조)과 후생 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정도가 포함된다. 대상이 되는 난치병 등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후생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정도)는 난치병 환자 등 재가생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특수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도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대상질환 검토회의에서 151개의 질환이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대상 질환의 요건은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며, 진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난치병이다.
이후 「장해자종합지원법」 대상질환 검토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2020년 11월에 추가된 대상질환을 포함하여 현재 「장해자종합지원법」상 대상질환은 366개로 정해져 있다. 대상 질환에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지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질환(골형성부전증, 근이영양증, 연골무형성증),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질환(망막색소변성증, 돌발성 난청)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 질환들이다. 예컨대 류마티스 관절염, 쿠싱 증후군, 크론병, 재생불량성 빈혈, 쇼그렌 증후군, 전신홍반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2023).
Ⅳ. 만성질환의 장애 인정 국내 법원 판결례 및 국가인권위 결정례 분석
1. 만성질환의 장애 인정 국내 판결례 분석
가. 판결례 선정 기준
본 연구는 2003년 장애 범주의 2단계 확대 이후 장애범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개별적 분쟁조정을 통하여 장애 인정 질환을 받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판결례를 분석하였다. 2021년 개정이 실질적으로 장애 범주 확장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장애인정 질환은 표 1과 같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분석 및 케이스노트 등의 사이트에서 해당 질환명으로 판결례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뚜렛증후군, 백반증, CRPS, 중증 복시 등 네 개의 질환에 관한 7개의 판결례가 검색되었다. 7개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 이유, 법원의 판단, 법원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 인정 및 불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장애 인정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질환인 노인성 치매와 HIV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2021년 확대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 질환
| No. | 장애 유형 | 확대 대상 | 비고 |
|---|---|---|---|
| 1 | 간장애 | 합병증 범위 확대(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 학회 의견 |
| 2 |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인정 | 국감, 판례 |
| 3 | 안면장애 | 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의 장애 인정 | 판례 |
| 4 | 시각장애 | 중증의 복시 장애 인정 | 다빈도민원 |
| 5 | 장루 요루장애 | 완전요실금 요루 장애 인정 | 다빈도민원 |
| 6 | 정신장애 | 뚜렛증후군, 기면증,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질환 추가 | 판례, 국감 |
출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2025. 1. 31. 검색, https://www.mohw.go. 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63162&seq=2
표 2
장애 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 No. | 사건번호 | 선고일 | 질환명 | 청구이유 | 법원판단 |
|---|---|---|---|---|---|
| 1 | 대법원 2016두50907 | 2019. 10. 30. | 뚜렛증후군 | 뚜렛증후군을 진단 받고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받음 | 1심 원고 패소, 2심, 3심 원고 승소(장애인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
| 2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3 58 | 2020. 10. 16. | 뚜렛증후군 | 뚜렛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정신장애 판정기준 상 규정한 정신질환의 진단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함 | 원고 승소(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
| 3 | 대전고등법원 2014누10231 | 2014. 6. 19. | 백반증 | 백반증 진단으로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를 결정받음 | 1심, 2심 원고 승소(장애등급 외 판정처분 취소) |
| 4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57 3 | 2020. 2. 27. | 백반증 |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안면부에 심한 백반증 앓고 있으나 장애상태가 등급심사 기준(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 비후 나 함몰, 결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음 | 원고 승소(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
| 5 |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6 33 | 2021. 4. 22. | 백반증 |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장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백반증이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받음 | 원고 승소(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
| 6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3 51 | 2018. 5. 3. | CRPS | 원고가 CRPS를 진단받고 상병에 따른 다리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주된 증상이 통증이며 근력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마비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 외’ 결정을 받음 | 원고 승소(장애등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 7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3 43 | 2020. 8. 13. | 중증 복시 | 복시로 인한 기능적 실명상태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신청하였으나, 교정 시력이 시각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처분을 받음 | 원고 승소(장애등급 외 판정처분 취소) |
출처: “종합법률정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2025, 2025. 6. 24. 검색,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 1001M01&l=N&c=900
나. 판결례 분석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미인정 질환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 소송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소송은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 거부 소송이다(대법원 2016두50907). 원고는 뚜렛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옥천면에 장애인등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이에 2015년 양평군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 1심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판결). 대법원에서는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별표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뿐 아니라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두50907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행정청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하지만, 예외적 절차 검토하여 장애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조윤화 외, 2022, p. 36). 이후 2020년 또 다른 뚜렛증후군 환자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낸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역시 원고에 대하여 한 정신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이 취소되었다. 역시 뚜렛 증후군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백반증의 장애 인정 판결이다. 가장 먼저 진행된 소송은 2013년 백반증 진단을 받아 이미 장애등록을 받은 사람이 장애 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 외’를 결정한 사안에 대한 장애등급 외 판정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장애등급 외 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807). 하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에 열거된 면상반흔, 색소침착 등의 사유는 안면장애사유의 ‘예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백반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의하게 삶의 질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고, 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4누10231). 2020년 다른 백반증 환자 역시 장애등급외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3년과 같이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 열거된 기준이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573). 2021년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백반증이 관찰되는 경우 자기 인식과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633).
백반증의 장애 인정 질환 판결은 안면장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의학적 기준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경험하는지 여부를 장애 판정의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역시 2021년 4월 장애인정 질환으로 포함된 질환이다. 질환의 장애 인정에도 CRPS의 장애 인정 관련 소송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08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CRPS 최종 진단을 받은 원고가 상병에 따른 다리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등급기준에 해당할 정도의 마비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외’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상병에 의한 근육약화로 좌측 다리의 운동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생긴 경우이므로 원고가 ‘한 다리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CRPS에 따른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351).
중증 복시 역시 2021년 4월 장애 인정 질환으로 추가된 질환으로, 이후 시각장애의 하위 범주에 ‘시력 장애’, ‘시야 장애’ 뿐 아니라 ‘겹보임(복시)’ 기준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6년 복시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좌안이 기능적 실명상태임을 이유로 장애등급(시각장애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시각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등급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좌안이 기능적 실명상태이므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고,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시각장애인(제6급)에 해당한다’고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뚜렛증후군의 장애 인정 판결을 참고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행정 입법 미비”로 간주하고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343).
분석한 판결의 중요한 법적 의의 중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장애 기준을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복지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이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행정법상 수범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열거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복지법이 급변하는 의료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장애 유형을 반영할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법령이 열거한 규정에서 장애 등록을 거부할 근거를 찾기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지 않는 현재의 열거된 규정을 ‘행정입법의 미비’로 간주하여 유연한 해석을 적용하였다. 이는 법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개별적 사안에 서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신체적·사회적 제약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판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법원이 행정부의 재량 판단을 전면 부정했다기보다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판단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방향성은 장애 범주를 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 장애인정 질환 목록이 확대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판결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정의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정 기준은 특정한 의학적 손상을 기반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나 기능적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장애 개념을 단순히 의학적 손상과 병리적 진단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제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영향’ 등을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WHO의 ICF가 제시하는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및 ‘참여 제한’(participation restriction)의 개념과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정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판결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기존의 의학적 모델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장애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장애 판정 기준 및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단순한 진단명 중심의 열거형 기준을 넘어 개인의 기능적 제약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뚜렛 증후군의 장애 인정 판결에서 법원이 예산과 관련된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을 무시하고 입법자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중권, 2021). 아울러, 장애인등록 신청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기준과 정도에 부합해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급여 행정이 장애인복지법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다(김남희, 2022). 이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의 재정 운용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중요하더라도, 장애 판단의 법적 기준이 실질적 제약에 기반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역할은 제도 미비에 따른 기본권 공백을 메우는 헌법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범주가 포괄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장애나 질환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적 정의와 행정적 판정 기준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 기능 제한 중심의 장애 판단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 논쟁 중인 사안 - 노인성 치매와 HIV 감염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에서는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3인의 청구인들은 ‘장애등급판정기준 -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운데 노인성 치매를 지적장애 판정에서 제외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2023년 3월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의 장애 인정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청구인들이 사건청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한국치매협회는 최근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당사자로 요건을 성립하도록 하여 2023년 9월 6일 새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으며(김영신, 2023. 9. 5.), 판결에 따라 노인성 치매의 장애 인정 논의의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한 HIV 감염인이 2023년 대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장애심사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김규현, 2024. 4. 17.). 그러나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기한 소송의 적격만을 따지다 소송이 종료되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동장의 반려가 무효인 점은 타당하지만,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어 원고는 결국 장애인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김충현, 2024. 11. 13.).
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의 인정 소송은 2021년 장애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지만, 차별을 경험한 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소모적인 개별적 분쟁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HIV/AIDS 감염처럼 소송을 통해 개인이 드러났을 때 사회적 낙인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자의 경우 장애 인정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노인성 치매와 HIV 감염의 사례처럼 소송 적격 여부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각하되거나 실체적 판단 없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도적 해결책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을 향한 차별과 권리 침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 차별 시정조사 및 구제조치 결정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의 결정례 중, 장애 범주 확대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례 가운데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 질환으로 반영된 결정례(기면증)와,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컸던 HIV/AIDS 감염인 결정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당한 편의 제공
2021년 4월 이전까지 기면증을 가진 환자는 장애 등록을 진행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장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2018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진정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기면증을 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주기, 별도의 시험실 제공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으로 2009년부터 기면 증세를 갖게 되었고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나 약물을 복용해도 일 5회 이상의 주간 졸림 증세가 심각해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기면증은 수면 공격을 받는 경우 무조건 수면에 빠져드는데 시험 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이 부여될 경우에 시험시간이 부족하여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시험시간 또는 쉬는 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수면 시 깨워주기 등의 편의 제공을 바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국가인권위 18진정0327200).
수능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경증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장애 등 장애 판정을 받은 등록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에 상응하는 특별조치가 주어지며, 그 외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타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지만 격리된 공간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관계인 진술, 전문가 자문, 관련 법률 및 해외 사례(미국 대학입시위원회에서는 기면증과 같은 장애를 가진 수험생이 서류를 제출하면 쉬는 시간 연장, 시험시간 정지와 휴식, 시험 중 음식 및 음료, 약 섭취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등을 토대로 하여 인적 편의 및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편의제공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장애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장애 차별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기면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일반 수험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시간 연장 및 쉬는 시간 연장은 일반 수험생과 등록 장애가 아닌 다른 증상을 가진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 배치된 시험장에 없고 서 있는 자세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생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수면 중인 수험생을 깨워주는 행위는 수험생이 깨어나지 않을 때 수험생과 감독관과의 책임소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실질적으로는 불수용하였지만, 이 권고는 추후 기면증(이 있으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자)이 장애인정 질환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HIV/AIDS 감염인 입원 거부의 장애 차별 인정
UN CRPD에서 HIV/AIDS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 개념을 한국이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HIV/AIDS 감염인은 장애인등록법상 장애 인정 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017년 HIV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피해자는 시력소실 및 편마비 기회감염이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받고자 국립○○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17년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해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 된다”며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국가인권위 17진정1037600).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HIV/AIDS 감염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장애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이다. 첫째 사안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 간의 차이, 즉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사안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장애인의 의료행 위와 의학연구 등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에게 재활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와 치료를 제공하여 야 할 의료기관이고, 특히 국립병원으로서 위상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를 장애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도 2022년 5월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한 HIV 감염인이 수술 전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였다(이슬하, 2022. 7. 21.).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HIV/AIDS 감염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거나, 장애인에 준하는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힘을 발휘하여 이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에서 개선사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범주 확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와 법적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손상과 특정 진단에 기반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법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평등법」은 장애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현저하고 장기적인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하며, 장애 유형을 특정한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사회법」에서도 역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며, 일부 만성질환이 장애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영국과 독일의 장애 기준은 신체적 손상의 유형이나 의료적 진단 자체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장애 범주를 확장하여 치료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난치병과 특정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장애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리스트를 대상질환 검토회의를 통해 매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 등록 인정이 되지 않은 만성질환자들이 일상과 사회생활에서의 제약과 차별을 경험한 후 소송 등의 개별적 분쟁조정을 통하여 장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의료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목록을 확대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애로 인한 권리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만성질환을 장애로 인정한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 정의를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기준 규정을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결들은 장애 판정 기준이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개인이 겪는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의 해석은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며, 향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장애 인정 절차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외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포괄적인 장애 개념을 근거로 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국가가 장애로 인정하는 만성질환의 목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이후 예외적 장애심사절차가 확대되며 장애를 경험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나, 예외적 인정기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미등록장애인이 장애 등록 절차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윤화 외, 2022, p. 19). 또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Mudrick & Schwartz, 2010; Yee & Breslin,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장애 인정 질환의 목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조항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평등법」의 장애 규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를 구성하는 모든 손상과 질환을 포괄하는 완전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19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환이 진단된 것처럼, 의학적 발견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애로 간주되는 질환과 손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독일의 장애 정의 방식을 참고하여, 장애 판단 기준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남희(2022)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제약’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영국 「평등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당한 기간’을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첫 발병 시점부터 지속되는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일 가능성이 있거나, 남은 생애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애 개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면서도, 법적·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범주의 확장은 장애인 복지의 법적·제도적 틀에서 배제되었던 만성질환자들에게 장애인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쟁점을 동반한다.
첫째, 장애 범주의 확대는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이지만, 동시에 복지 수급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에 현실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의 장애 관련 복지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0.83%에 그쳐 2019년 OECD 평균(2.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급여 수급 비율 또한 2012년 기준 1.57%로 OECD 평균 (6%)에 비해 크게 낮다(오욱찬, 2023). 이는 단순히 급여 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포괄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와도 관련된다. 장애 범주 확대는 단순한 수급자 증가를 넘어, 지금까지 제도적 보호 바깥에 있던 다양한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적 재정 부담보다 장애 개념의 포용성과 제도의 정당성 확보가 복지국가로서의 책무 수행에 있어 더 본질적인 과제임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 범주 확대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 범주의 확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이는 제도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행정적 준비와 사회적 인식 형성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 방식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과 장애인정 간의 제도적 연계를 재구조화하거나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장애 범주 확대 자체가 곧바로 급여 지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소득, 생활 조건, 필요 수준에 따라 급여의 수준과 형태를 다양화하거나 차등화함으로써, 포괄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 인정의 문턱은 낮추되, 복지 재정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유지하는 접근으로서 제도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면, 장애 범주의 확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복지 재정, 제도 설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장애 경험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함께 요구되는 다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장애 범주 확대가 단지 수급자 수의 증가가 아닌, 제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성과 정당성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장애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 개념이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재구성되고, 다양한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Notes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의 기준을 제시하여 복지 정책의 주요 기준이 되지만, 국내 모든 장애 관련 제도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운영하면서도 일부 직업생활상 제약이 있는 사람을 고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 방지를 위한 보다 넓은 의미의 장애 개념을 포함하고자 하나,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개별적 분쟁조정을 통해 일부 만성질환자의 차별 경험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조윤화 외, 2022, p. 9). 이처럼 법률마다 적용되는 장애의 정의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법과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References
. (2024. 4. 17). 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 국내 첫 재판 시작.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6993.html
. (2023. 9. 5). 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156900530
. (2024. 5. 30). 장애 등록에도 여전한 '인정' 장벽···'산 넘어 산' 투렛장애인.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59
. (2024. 11. 13). 국내 첫 HIV 장애인정 소송서 법원 “단체장 아닌 동장 반려는 무효”. 뉴스민. https://www.newsmin.co.kr/news/110892/
. (2025). 종합법률정보. 2025. 6. 24. 검색,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01M01&l=N&c=900
. (2020. 12. 31).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2790&tag=&nPage=264
. (2021. 1. 19).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363162&seq=2
. (2022. 7. 21). “‘일반 환자’ 보호해야”, HIV 감염인 수술 거부한 병원 인권위 진정.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3
(1992). Disability, handicap,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3(1), 105-119. [PubMed]
(1982). Chronic illness as biographical disruption.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4(2), 167-182. [PubMed]
(2013, April). JUDGMENT OF THE COURT (Second Chamber).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36161&doclang=EN&utm_source=chatgpt.com
, & (2010). Health care under the ADA: a vision or a mirage?.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3(4), 233-239. [PubMed]
(2011). Equality Act 2010 - Guidance on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questions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quality-act-guidance/disability-equality-act-2010-guidance-on-matters-to-be-taken-into-account-in-determining-questions-relating-to-the-definition-of-disability-html
, , , & (2018). Prevalence of disabilities and health care access by disability status and type among adults—United States, 2016.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7(32), 882-887. https://www.cdc.gov/mmwr/volumes/67/wr/mm6732a3.htm?scid=mm6732a3 [PubMed] [PMC]
, , & (2014). Research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7(1), 6-12. [PubMed]
(n.d.(a)). Disability Evaluation Under Social Security - Listing of Impairments - Adult Listings (Part A).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AdultListings.htm#:~:text=1
(n.d.(b)). Disability Benefits | How Does Someone Become Eligible?. https://www.ssa.gov/benefits/disability/qualify.html#:~:text=3,the%20list%20of%20disabling%20conditions
(2022).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2022. https://www.ssa.gov/policy/docs/statcomps/di_asr/2022/sect05.html#table68#:~:text=In%20December%C2%A02022%2C%20about%2011%C2%A0million%20people,benefits%20from%20both%20programs%20concurrently
(2018, July). Chronische Erkrankungen können als Behinderung anerkannt werden. https://www.vdk.de/aktuelles/tipp/unsichtbares-leiden-chronische-erkrankungen-koennen-als-behinderung-anerkannt-werden
(2014).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9&menuid=001004001001&boardid=609865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0050100&bid=0056&act=view&list_no=349290&tag=&nPage=1
(1976).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https://disability-studies.leeds.ac.uk/wp-content/uploads/sites/40/library/UPIAS-fundamental-principles.pdf
, & (2010). Achieving accessible health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y the ADA is only part of the solution.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3(4), 253-261.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5-1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30

- 1967Download
- 738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