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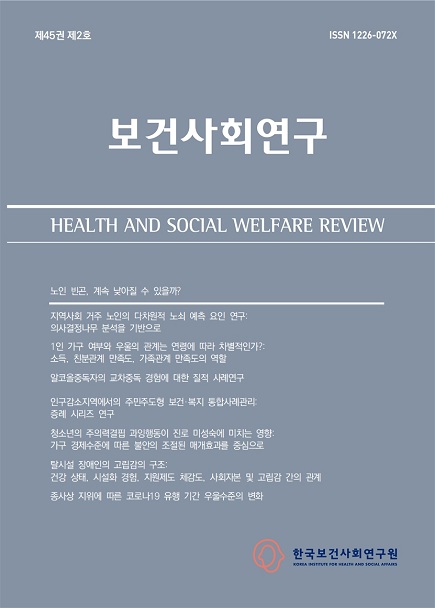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노인학대 피해경험 및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대한 분석
Experiences of Elder Abuse and Analysis of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Kim, Jungsook1; Lee, Miji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330-351,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330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의 추세를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행위자 주체의 분포(배우자, 자녀, 친구·이웃, 기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연령, 기간, 코호트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2011∼2020년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신체적 학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행하는 주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이 아닌 친구·이웃이 행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신체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친구·이웃에 의한 학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초록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은 15.7%로 추정하고 있다(Yon et al., 2017). 2023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이 학대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5.9%로 나타나(강은나 외, 2023),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고 연구대상의 표본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차이를 보여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총 3,549건이며 그중 2,038건(57.4%)이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되었다. 그 후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21,936건이었으며 이중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32.0%)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6, 2024). 노인 인구가 같은 기간 438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에 비해 노인학대 사례는 약 3.5배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배우자 폭력 피해율은 2010년 40.7%에서 2022년 25.8%로 감소하였으며 배우자 폭력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율도 같은 기간 10.0%에서 4.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외, 2010; 김정혜 외, 2022). 전국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노인학대 피해경험률 역시 2011년에는 12.7%이었으나, 2014년에는 9.9%, 2017년에는 9.8%, 2020년에는 7.3%, 2023년에는 5.9%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경희 외, 2012, 2014, 2017; 이윤경 외, 2020; 강은나 외 2023).
정리하면, 노인학대 신고·접수에 의한 노인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경험하는 노인학대 피해율의 추세, 유형별 피해경험률 추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인권의식 및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기간 효과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년기에 진입하는 새로운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와 다르기 때문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코호트 효과와 기간 효과는 연령 효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령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있어 연령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김지영, 김기범, 2007; 박현승, 2022; 강은나 외, 2023; Lachs et al., 1997) 연령이 낮을수록 학대피해 경험률이 증가한다는 연구(최정혜, 2000; 권중돈, 2004)도 있어서 노인학대와 연령과의 연관성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적 변화 등에 따른 기간 효과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가족구조 및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통계청, 2022; 김민수 외, 2024), 노인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의 변화(정진성 외, 2011; 이인선 외, 2016; 김정혜 외, 2022; 한준 외, 2022), 기초연금 수급액의 지속적인 인상 및 국민연금 수급률의 증가로 인한 노인빈곤율의 감소(김연명, 주수정, 2023; 홍성운,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공적 돌봄보장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감소하였을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경험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및 제도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 효과가 나타나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기간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아진 것은 코호트 효과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노인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노인의 출생 코호트를 조사한 결과 이전 세대보다 건강상태가 좋았으며(Carstensen, 2014/2016), 16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집단에 대해 출생 코호트를 연구한 결과 이전 세대의 인지기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Zelinski & Kennison, 2007).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를 16년간(2004~2020) 추적한 결과, 1930년대~1940년대 코호트에 비해 1950년대 코호트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남궁은하, 2022). 정리하면, 출생연도가 늦은 코호트의 노인들은 출생연도가 빠른 코호트의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수준, 건강상태, 인지상태, 경제적 상태가 더 양호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도 높아 학대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Zink et al., 2003).
한편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감소하는 가구구조의 변화는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동거가구의 감소는 자녀 학대행위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학대행위자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구성 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학대의 유형별로 학대행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추세를 살펴보고, 노인학대 피해경험의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년도 자료에 대해서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연도별 학대행위자(배우자, 자녀, 친구·이웃, 기타)의 분포 변화를 기술한다. 또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PC(Age-Period-Cohort)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학대의 추세 및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의 추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학대행위자의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 노인학대 피해경험은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영향을 받는가?
Ⅱ. 문헌검토
1. 노인학대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르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학대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 제 4호에서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2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의 노인학대 경험사례를 다루고 있으므로 정경희 외(2012, 2014, 2017)와 이윤경 외(2020)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노인학대 유형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을 분석하였다. 비록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하위 유형인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노인학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학대피해율 추세 분석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2005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17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기관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 현재 38개소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긴급출동, 피해자 임시보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관련 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민·관협력기반의 전달체계로서 피해노인에 대한 초기 개입뿐만 아니라 경찰, 지자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의료기관 등과의 다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4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도입 당시 5개 직업군에 한정되었던 신고의무자는 2020년 17개 직업군으로 확대되었고 노인학대 신고 촉진을 위한 신고자의 신분보장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2015년 개정에서는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은 상호 동행을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법경찰이 노인학대를 인지한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은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제처, 2025).
3. 노인학대 행위자 분포의 변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가 80~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용호 외 2019;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그러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행위자 분포에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통계가 기술되어 있는데, 201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아들과 딸이 60%, 배우자가 12.4%, 며느리와 사위가 7.4%, 친구·이웃 등 타인이 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아들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배우자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들과 딸(34%), 친구·이웃 등 타인(3.5%), 며느리와 사위(1.7%)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아들 학대행위자가 감소하고 배우자 학대행위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노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닌 아들이나 장남이 부양부담으로 노인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김지영, 2005; 강윤희 외, 2011), 아들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아들과 동거하는 비중이 줄어듦으로써 아들 학대행위자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돌봄에 대한 부담 등이 증가하여 배우자가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행위자 중 가족이 아닌 친구·이웃 등 타인의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노인복지관에서는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나 노인따돌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지현, 정은숙, 2019; 이창숙, 하정화, 2019; 박선희, 정원철, 2020). 노인따돌림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노인따돌림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상호 간 또는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하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박지현, 정은숙, 2019; 이창숙, 하정화, 2019; 박선희, 정원철, 2020). 본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분포 중 배우자, 자녀, 친구·이웃 등의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4.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연령(age)-기간(period)-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본 연구에서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가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사람이 나이 듦에 따라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노인학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고연령일수록 의존성이 높아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로 인해 노인이 학대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이연호, 2002; 김지영, 김기범, 2007; 박현승, 2022; Hwalek. et al., 1996; Lachs et al., 1997). 반면, 권중돈(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피해 경험률이 낮았으며, 최정혜(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를 받는 비율이 감소하며, 특히 75세 이상에서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과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효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 혹은 사회적 환경변화가 그 시대의 사회구성원 전체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또는 어떠한 행위 등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김수정, 2018). 기간 효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족구조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노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 및 홍보, 노인빈곤율의 감소, 공적 돌봄제도의 확대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족구조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단독가구가 2011년 19.6%에서 2023년 32.8%로 증가하고 노인부부가구는 같은 기간 48.5%에서 55.2%로 증가하는 등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녀동거가구는 2011년 27.3%에서 2023년 10.3%로 줄어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학대행위자는 주로 노인과 동거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동거가구의 감소는 동거자녀가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한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같은 기간 48.7%에서 62.1%로 증가하는 등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22).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감소로 이어져 방임과 같은 학대를 행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노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 및 홍보가 노인학대 발생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 정진성 외(2014)가 전국 1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05년, 2008년, 2011년의 인권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이 확대되면서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인권감수성이 고양되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1년 30.3%에서 2022년에는 71.0%로 크게 향상되었다(정진성 외, 2011; 한준 외, 2022). 전체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은 노인학대 발생을 줄이는 기간 효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 증가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을 활발히 수행한 점 역시 노인학대 발생 감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노인빈곤율의 감소 추이가 노인학대 발생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46.5%에서 2020년에는 38.9%로 2010년대 초반 이후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3). 최근 10여년 동안 노인빈곤율이 소폭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원진 외, 2022).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은 노인학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은 학대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권중돈, 2004; 정경희 외, 2010). 따라서 제도적 변화의 결과인 노인빈곤율의 감소는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넷째, 공적 노인돌봄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노인학대 발생을 낮추는 기간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대표적인 공적 노인돌봄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급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행 초기인 2011년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은 564만여 명으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33만 7천여 명이다. 2022년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은 938만여 명이며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96만 9천여 명이다(국민건강보험, 2012, 2023). 동기간 노인인구가 66.3% 증가한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88% 증가하였다. 그동안 가족이 주로 노인돌봄을 책임져 왔는데, 돌봄부담은 가족갈등, 경제적 부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쇠약 등으로 이어지면서(권민영 외, 2010; 백용운, 최수일, 2010)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여 왔다(이미진, 김혜련, 2016; 김동식 외, 2018).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급자의 증가는 돌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예방 또는 중지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코호트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태어난 집단으로 보통 5년(Maddox & Wiley, 1976) 또는 10년(Glenn, 1977) 간격으로 구성된 출생 코호트를 의미하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연령에 소속되어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다(허종호, 2020).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으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사회일수록 코호트 간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허종호, 2020; Mannheim, 1952). 예를 들어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 가족부양 의무감이 강하고 가족 내 갈등이나 학대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제성장기 이후 성인이 된 세대는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높아 학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출생 코호트 간 역사적 경험과 가족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대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사회적·제도적 배경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대응 방식, 피해경험률 등에 있어서 코호트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자료는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이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10,997명, 2014년 10,451명, 2017년 10,299명, 2020년 10,097명으로 총 41,844명이다. 이 중 대리응답자 661명을 제외하였으며 결측값이 발생한 402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총 40,781명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포털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으며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의면제를 확인받았다(과제번호: 7001355-202209-E-175).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노인학대 피해경험 여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관되게 포함된 5가지 학대 유형에 대해 지난 1년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는 ‘타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대화 기피, 의견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등).’, 경제적 학대는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신체적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았다(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을 주지 않음).’, 경제적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이다. 각각의 학대 유형에 대하여 ‘있음(1)’, ‘없음(0)’의 값을 부여하여 학대유형별 피해경험 변수를 산출하였다.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다. 5가지 학대유형에 대하여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사실이 있으면 ‘있음(1)’, ‘없음(0)’의 값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연령, 기간, 코호트는 3개 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령과 코호트의 범주값을 관찰 기간 간격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연령, 기간, 코호트(APC) 분석을 위해 첫째, 연령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9세까지 3세 단위로 구분하고 80세 이상을 통합하였다. 둘째, 기간은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3개 연도 간격으로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총 4개 연도로 구분하였다. 셋째, 코호트는 기간에서 연령을 뺀 값으로 1935년생부터 1955년생까지 3년 단위로 구분하고 1934년 이전 출생자를 통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령, 기간, 코호트 모델
| 연령 | 2011년 | 2014년 | 2017년 | 2020년 |
|---|---|---|---|---|
| 65세~67세 | 1944년~1946년 | 1947년~1949년 | 1950년~1952년 | 1953년~1955년 |
| 68세~70세 | 1941년~1943년 | 1944년~1946년 | 1947년~1949년 | 1950년~1952년 |
| 71세~73세 | 1938년~1940년 | 1941년~1943년 | 1944년~1946년 | 1947년~1949년 |
| 74세~76세 | 1935년~1937년 | 1938년~1940년 | 1941년~1943년 | 1944년~1946년 |
| 77세~79세 | 1934년 이전 | 1935년~1937년 | 1938년~1940년 | 1941년~1943년 |
| 80세 이상 | 1934년 이전 | 1935년~1937년 | 1938년~1940년 | |
| 1934년 이전 | 1935년~1937년 | |||
| 1934년 이전 |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자녀, 친구·이웃, 기타로 구분하였다. 자녀는 노인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기타는 노인의 손자녀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기타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한다.
3. 분석 방법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연도별로 전반적인 학대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분포에 대한 빈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APC(Age, Period, Cohort) 모델을 사용하여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대유형별 피해경험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APC 분석 방법은 오래 축적한 종단자료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시한 횡단자료에 적합하다(최슬기 외, 2019). 본 연구에 활용된 노인실태조사 자료는 사회·경제·문화 및 정책 등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시계열적인 변화 추세와 노인의 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경희 외, 2017).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발생 추세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APC 분석은 연령과 코호트의 차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학대 연구에 유용하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코호트 효과는 연령 효과와 구분할 수 없다. 어떤 특정시점에서 연령을 알면 출생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서 연령과 코호트의 개념은 중복된다. 따라서 연령, 기간, 코호트 변수는 서로 선형적 의존관계(연령=기간-코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PC 분석에서 사용되는 혼합모형(General linear mixed models)을 활용하였다(Yang & Land, 2013, pp. 69-70). 혼합모형은 기간과 코호트 효과를 개인의 연령에 따라 배열되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으로 개념화하며, 기간과 코호트를 무선 효과(random effects)로 모델링한다. 이러한 맥락적 접근법은 APC 분석의 식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혼합모형 분석인 SAS ver 9.4 Proc Glimmix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중 하나의 요인이나 두 가지 조합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Yang & Land(2013, p. 126)가 제안한 분석 순서를 따랐다. 두 가지 변수만 분석에 투입된다면 식별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고 보다 단순화된 모델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단계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대한 기술통계, 이원분석을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분석자료가 연령, 기간, 코호트 중 하나의 요인이나 두 가지 조합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효과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를 제외한 단순화된 모델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모델1에서는 기간 자체의 고정효과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둘째, 모델2에서는 기간 변수를 통제한 후 연령의 고정효과를 분석하여 연령대별 특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기간 변수를 통제한 후에 연령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코호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모델3에서는 코호트의 자체의 고정효과를 분석하여 출생집단별 특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모델4에서는 연령 변수를 통제한 후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여 동일 연령대에서의 출생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델3과 모델4에서 코호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4에서 코호트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는 연령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Yang & Land(2013, p. 126)이 설명한 것처럼 2단계에서 1개 이상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3단계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분석까지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하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을 비교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의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은 12.7%로 나타났고, 2014년은 9.9%, 2017년은 9.8%, 2020년은 7.2%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은 관찰된 기간동안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2011∼2020년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
| (단위: 명, %) | |||||||
|---|---|---|---|---|---|---|---|
| 변수 | 구분 | 2011년(n=10,502) | 2014년(n=10,279) | 2017년(n=10,069) | 2020년(n=9,931) | 통계량(χ2) | p |
| 노인 학대 여부 | 예 | 1,332(12.7) | 1,019(9.9) | 990(9.8) | 716(7.2) | 170.992*** | .000 |
| 아니오 | 9,170(87.3) | 9,260(90.1) | 9,079(90.2) | 9,215(92.8) | |||
학대유형별로 피해경험률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경제적 방임의 감소가 가장 컸으며(92.0% 감소), 다음으로 신체적 방임(78.6% 감소), 경제적 학대(73.3% 감소), 정서적 학대(30.0% 감소)의 순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학대는 2011년 0.5%에서 2020년 1.3%로 160%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참조). 노인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학대유형별 빈도와 비중은 <부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3
2011∼2020년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 (단위: 명, %) | |||||||
|---|---|---|---|---|---|---|---|
| 구분 | 2011년 (n=10,502) | 2014년 (n=10,279) | 2017년 (n=10,069) | 2020년 (n=9,931) | 계 (n=40,781) | 통계량(χ2) | p |
| 신체적 학대 | 50(0.5) | 15(0.1) | 34(0.3) | 131(1.3) | 230(0.6) | 143.650*** | .000 |
| 정서적 학대 | 988(9.4) | 749(7.3) | 741(7.4) | 653(6.6) | 3,131(7.7) | 65.004*** | .000 |
| 경제적 학대 | 153(1.5) | 32(0.3) | 41(0.4) | 37(0.4) | 263(0.6) | 146.276*** | .000 |
| 신체적 방임 | 144(1.4) | 157(1.5) | 168(1.7) | 27(0.3) | 496(1.2) | 101.219*** | .000 |
| 경제적 방임 | 258(2.5) | 284(2.8) | 232(2.3) | 23(0.2) | 797(2.0) | 209.123*** | .000 |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1년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는 23.0%, 자녀는 36.9%, 친구·이웃은 31.6%, 기타는 8.5%로 나타나 자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0년 학대행위자 통계를 보면, 배우자는 22.5%, 자녀는 23.2%, 친구·이웃은 51.2%, 기타는 3.1%로 나타나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친구·이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기간 증가추세를 보인 유일한 학대 유형인 신체적 학대에서도 친구·이웃 학대행위자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표 4 참조).
표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술통계
| (단위: 명, %) | ||||||||||
|---|---|---|---|---|---|---|---|---|---|---|
| 구분 | 2011년 | 2014년 | ||||||||
| 배우자 | 자녀 | 친구·이웃 | 기타 | 계 | 배우자 | 자녀 | 친구·이웃 | 기타 | 계 | |
| 신체적 학대 | 21(42.0) | 8(16.0) | 12(24.0) | 9(18.0) | 50(100) | 3(17.6) | - | 8(47.1) | 6(35.3) | 17(100) |
| 정서적 학대 | 313(31.7) | 168(17.0) | 426(43.1) | 81(8.2) | 988(100) | 70(14.4) | 83(17.0) | 306(62.7) | 29(5.9) | 488(100) |
| 경제적 학대 | 18(11.7) | 29(18.8) | 66(42.9) | 41(26.6) | 154(100) | - | 4(14.3) | 21(75.0) | 3(10.7) | 28(100) |
| 신체적 방임 | 13(9.0) | 130(89.6) | - | 2(1.4) | 145(100) | 4(2.9) | 131(95.6) | - | 2(1.5) | 137(100) |
| 경제적 방임 | 2(0.8) | 252(98.4) | - | 2(0.8) | 256(100) | - | 252(99.6) | - | 1(0.4) | 253(100) |
| 전체 | 367(23.0) | 587(36.9) | 504(31.6) | 135(8.5) | 1,593(100) | 77(8.4) | 470(50.9) | 335(36.3) | 41(4.4) | 923(100) |
| 구분 | 2017년 | 2020년 | ||||||||
| 배우자 | 자녀 | 친구·이웃 | 기타 | 계 | 배우자 | 자녀 | 친구·이웃 | 기타 | 계 | |
| 신체적 학대 | 2(20.0) | - | 8(80.0) | - | 10(100) | 1(1.2) | 2(2.4) | 73(88.0) | 7(8.4) | 83(100) |
| 정서적 학대 | 81(16.6) | 103(21.0) | 276(56.3) | 30(6.1) | 490(100) | 114(28.6) | 81(20.4) | 196(49.2) | 7(1.8) | 398(100) |
| 경제적 학대 | - | 6(16.7) | 29(80.5) | 1(2.8) | 36(100) | 1(5.0) | 3(15.0) | 16(80.0) | - | 20(100) |
| 신체적 방임 | 4(2.4) | 164(97.0) | - | 1(0.6) | 169(100) | 9(31.0) | 19(65.5) | - | 1(3.5) | 29(100) |
| 경제적 방임 | 1(0.4) | 230(99.2) | - | 1(0.4) | 232(100) | - | 24(92.3) | - | 2(7.7) | 26(100) |
| 전체 | 88(9.4) | 503(53.7) | 313(33.4) | 33(3.5) | 937(100) | 125(22.5) | 129(23.2) | 285(51.2) | 17(3.1) | 556(100) |
다음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도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4개 연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각각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2020년은 65세~67세와 80세 이상이 증가하고 71세~73세와 74세~76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시점과 연령으로 산출한 출생연도 코호트는 2011년의 경우 1934년 이전 출생자가 28.8%로 가장 높았고 1935~1937년생이 15.8%로 가장 낮았다. 2014년은 1947~1949년생이 20.8%로 가장 높았고 1935~1937년생이 11.2%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2017년은 1947년~1949년생이 19.9%로 가장 높았고 1933~1937년생이 9.4%로 가장 낮았으며 2020년은 1953~1955년생이 21.2%로 가장 높았고 1934년 이전 출생자가 4.4%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며,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6.1%에서 2014년에는 5.5%로 조금 줄었다가 2017년에는 6.3%로 늘었고 2020년에는 4.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자가 소유 노인 역시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수는 2011년에 비해 2020년에 감소하였으며 인지기능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울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족 및 친척 수는 2011년에 비해 2020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단위: %) | ||||||||
|---|---|---|---|---|---|---|---|---|
| 변수 | 구분 | 2011년 (n=10,502) | 2014년 (n=10,279) | 2017년 (n=10,069) | 2020년 (n=9,931) | 통계량(χ2) | p | |
| 연령 | 65세~67세 | 17.8 | 20.8 | 18.8 | 21.2 | 288.373*** | .000 | |
| 68세~70세 | 18.9 | 16.5 | 19.9 | 18.2 | ||||
| 71세~73세 | 18.6 | 17.2 | 13.6 | 14.2 | ||||
| 74세~76세 | 15.8 | 14.3 | 15.4 | 13.0 | ||||
| 77세~79세 | 12.1 | 11.2 | 11.7 | 13.1 | ||||
| 80세 이상 | 16.8 | 19.9 | 20.7 | 20.3 | ||||
| 코호트 | ’53~’55년생 | - | - | - | 21.2 | 15,648.818*** | .000 | |
| ’50~’52년생 | - | - | 18.8 | 18.2 | ||||
| ’47~’49년생 | - | 20.8 | 19.9 | 14.2 | ||||
| ’44~’46년생 | 17.8 | 16.5 | 13.6 | 13.0 | ||||
| ’41~’43년생 | 18.9 | 17.12 | 15.4 | 13.1 | ||||
| ’38~’40년생 | 18.6 | 14.3 | 11.7 | 9.8 | ||||
| ’35~’37년생 | 15.8 | 11.2 | 9.4 | 6.0 | ||||
| ’34년 이전 | 28.8 | 19.9 | 11.3 | 4.4 | ||||
| 성별 | 남성 | 43.2 | 41.8 | 42.5 | 43.1 | 5.671 | .129 | |
| 여성 | 56.8 | 58.2 | 57.5 | 56.9 | ||||
| 교육수준 | 무학 | 31.5 | 30.2 | 23.7 | 10.3 | 2,105.980*** | .000 | |
| 초등학교 | 35.5 | 32.1 | 34.3 | 31.6 | ||||
| 중학교 | 13.5 | 13.1 | 17.0 | 23.4 | ||||
| 고등학교이상 | 19.5 | 24.5 | 25.0 | 34.7 | ||||
| 가구형태 | 노인단독가구 | 19.8 | 23.2 | 24.0 | 20.0 | 614.588*** | .000 | |
| 노인부부가구 | 48.6 | 44.7 | 48.7 | 58.9 | ||||
| 자녀동거가구 | 27.0 | 28.0 | 23.5 | 19.5 | ||||
| 기타 가구 | 4.6 | 4.0 | 3.8 | 1.7 | ||||
| 거주지역 | 동부 | 67.8 | 76.5 | 68.7 | 75.7 | 316.502*** | .000 | |
| 읍면부 | 32.2 | 23.5 | 31.3 | 24.3 | ||||
| 경제활동 | 예 | 33.8 | 28.9 | 31.0 | 37.4 | 186.067*** | .000 | |
| 아니오 | 66.2 | 71.1 | 69.0 | 62.6 | ||||
| 수급자 여부 | 예 | 6.1 | 5.5 | 6.3 | 4.7 | 31.849*** | .000 | |
| 아니오 | 93.9 | 94.5 | 93.7 | 95.3 | ||||
|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하지 않음 | 65.9 | 67.6 | 63.0 | 50.6 | 750.249*** | .000 | |
| 건강함 | 34.1 | 32.4 | 37.0 | 49.4 | ||||
| 자가유무 | 예 | 74.3 | 69.2 | 71.0 | 79.8 | 337.261*** | .000 | |
| 아니오 | 25.7 | 30.8 | 29.0 | 20.2 | ||||
| 변수 | 2011년(n=10,502) | 2014년(n=10,279) | 2017년(n=10,069) | 2020년(n=9,931) | 통계량(F) | p | ||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
| 만성질환 수 | 2.39(1.75) | 2.35(1.71) | 2.50(1.72) | 1.77(1.44) | 389.813*** | .000 | ||
| 인지기능(MMSE-D S) | 20.69(2.84) | 20.15(3.34) | 21.34(2.48) | 20.97(4.06) | 246.107*** | .000 | ||
| 우울(SGDS-K) | 4.93(4.51) | 5.38(4.58) | 4.09(4.08) | 3.48(3.37) | 421.355*** | .000 | ||
| 가족 및 친척 수 | 1.35(1.96) | 1.07(1.44) | 0.84(1.23) | 2.09(1.91) | 1,071.364*** | .000 | ||
연구대상자 특성의 변화는 문헌연구에서 검토하였던 노인가구구조의 변화, 빈곤율의 감소라는 기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출생연도가 늦은 노인코호트 유입으로 인한 교육수준의 증가 및 건강상태의 증진은 노인학대 피해경험률 감소로 이어지는 코호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APC 모형 분석 결과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중 하나의 요인이나 두 가지 조합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Yang & Land(2013, p. 126)가 제안한 분석순서를 따랐다. 1단계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대한 기술통계, 그래프, 이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령과 조사시점별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기간이 최근일수록 피해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5~67세는 2011년 13.2%에서 2020년 5.6%로 가장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출생코호트와 조사시점별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7년은 출생연도가 가장 늦은 코호트의 피해경험률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호트의 출생연도와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2020년 자료에서 출생연도가 가장 늦은 코호트인 ‘53∼’55년생보다 ‘35-’37년생의 학대 피해경험률이 더 낮았다(표 6 참조).
표 6
출생코호트와 조사시점별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
| (단위: %) | |||||
|---|---|---|---|---|---|
| 코호트 | 2011년(n=10,502) | 2014년(n=10,279) | 2017년(n=10,069) | 2020년(n=9,931) | 계(n=40,781) |
| ’34년생 이전 | 12.0 | 9.6 | 10.5 | 9.4 | 10.8 |
| ’35~’37년생 | 13.2 | 11.6 | 10.9 | 5.3 | 11.2 |
| ’38~’40년생 | 12.2 | 9.9 | 10.4 | 8.1 | 10.5 |
| ’41~’43년생 | 13.2 | 10.7 | 10.2 | 7.6 | 10.7 |
| ’44~’46년생 | 13.2 | 9.6 | 10.6 | 9.4 | 10.9 |
| ’47~’49년생 | - | 8.9 | 9.3 | 6.2 | 8.3 |
| ’50~’52년생 | - | - | 8.3 | 7.6 | 7.9 |
| ’53~’55년생 | - | - | - | 5.6 | 5.6 |
| 계 | 12.7 | 9.9 | 9.8 | 7.2 | 9.9 |
다음으로 Yang & Land(2013, p. 126)가 제안한 2단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모델1에서 기간 변수를 투입하여 고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비해 2014년(p<.001), 2017년(p<.001) 2020년(p<.001) 모두 학대피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조사 시점별 노인학대 피해율에 뚜렷한 변화 추세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2에서 기간 변수와 연령 변수를 투입하여 고정효과를 검증하였다. 연령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기간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연령의 변화와 무관하게 각 조사 시점의 특수한 사회적·정책적 요인 등이 노인학대 피해율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노인학대 피해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변수에 대한 고정효과의 F 통계량(F=1.6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령 효과를 지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델3에서는 코호트 변수의 고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델4에서는 연령 변수와 코호트 변수를 투입하여 고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2와 마찬가지로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코호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 고정효과 | 모델 1 | 모델 2 | ||||
|
|
||||||
| 계수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계수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
|
||||||
| 절편 | -1.9980 | 0.02959 | <.0001 | -2.1083 | 0.05260 | <.0001 |
|
|
||||||
| 기간 변수(2011 준거) | ||||||
| 2020 | -0.9275 | 0.05443 | <.0001 | -0.9124 | 0.05470 | <.0001 |
| 2017 | -0.2223 | 0.04471 | <.0001 | -0.2167 | 0.04478 | <.0001 |
| 2014 | -0.3089 | 0.04535 | <.0001 | -0.3031 | 0.04542 | <.0001 |
|
|
||||||
| 연령 변수(65~67세 준거) | ||||||
| 80세 이상 | 0.08441 | 0.05997 | 0.1895 | |||
| 77~79세 | 0.1184 | 0.06499 | 0.0986 | |||
| 74~76세 | 0.1482 | 0.06179 | 0.0374 | |||
| 71~73세 | 0.1566 | 0.06104 | 0.0281 | |||
| 68~70세 | 0.1169 | 0.06158 | 0.0870 | |||
|
|
||||||
| 코호트 변수(’53~’55년생 준거) | ||||||
| ’34년생 이전 | ||||||
| ’35~’37년생 | ||||||
| ’38~’40년생 | ||||||
| ’41~’43년생 | ||||||
| ’44~’46년생 | ||||||
| ’47~’49년생 | ||||||
| ’50~’52년생 | ||||||
|
|
||||||
| 고정효과(Type Ⅲ tests) | ||||||
| 기간 변수 | F=97.92*** | F=93.85*** | ||||
| 연령 변수 | - | F=1.69 | ||||
| 코호트 변수 | - | - | ||||
|
|
||||||
| 무선효과 | ||||||
| 코호트 변수 | - | - | - | - | ||
| 기간 변수 | - | - | - | - | ||
|
|
||||||
| model fit | 221406.4 | - | 221468.2 | |||
| -2Res Log Pseudo-Likelihood | ||||||
|
|
||||||
| Gener. Chi-Square/DF | 1.00 | - | 1.00 | |||
|
|
||||||
| 고정효과 | 모델 3 | 모델 4 | ||||
|
|
||||||
| 계수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계수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
|
||||||
| 절편 | -2.3697 | 0.1956 | <.0012 | -2.2478 | 0.3691 | 0.0089 |
|
|
||||||
| 기간 변수(2011 준거) | ||||||
| 2020 | ||||||
| 2017 | ||||||
| 2014 | ||||||
|
|
||||||
| 연령 변수(65~67세 준거) | ||||||
| 80세 이상 | -0.1011 | 0.2766 | 0.7148 | |||
| 77~79세 | -0.01821 | 0.2124 | 0.9317 | |||
| 74~76세 | 0.04144 | 0.1669 | 0.8039 | |||
| 71~73세 | 0.08923 | 0.1213 | 0.4620 | |||
| 68~70세 | 0.08847 | 0.07978 | 0.2675 | |||
|
|
||||||
| 코호트 변수(’53~’55년생 준거) | ||||||
| ’34년생 이전 | -0.07991 | 0.08783 | 0.3629 | -0.2486 | 0.3642 | 0.4948 |
| ’35~’37년생 | -0.02938 | 0.07957 | 0.712 | -0.2156 | 0.3037 | 0.4777 |
| ’38~’40년생 | 0.0175 | 0.07271 | 0.8098 | -0.156 | 0.2562 | 0.5426 |
| ’41~’43년생 | 0.04086 | 0.06904 | 0.5539 | -0.139 | 0.2106 | 0.5092 |
| ’44~’46년생 | 0.04849 | 0.06979 | 0.4872 | -0.09741 | 0.1641 | 0.5528 |
| ’47~’49년생 | 0.04379 | 0.07197 | 0.5429 | -0.05094 | 0.1220 | 0.6763 |
| ’50~’52년생 | 0.01067 | 0.07897 | 0.8925 | -0.03779 | 0.09867 | 0.7017 |
|
|
||||||
| 고정효과(Type Ⅲ tests) | ||||||
| 기간 변수 | - | - | ||||
| 연령 변수 | - | F=1.03 | ||||
| 코호트 변수 | F=0.59 | F=0.10 | ||||
|
|
||||||
| 무선효과 | ||||||
| 코호트 변수 | - | - | - | - | ||
| 기간 변수 | 0.14 | 0.1161 | 0.1279 | 0.1124 | ||
|
|
||||||
| model fit | 221402.0 | 221420.2 | ||||
| -2Res Log Pseudo-Likelihood | ||||||
|
|
||||||
| Gener. Chi-Square/DF | 1.00 | 1.00 | ||||
참고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기간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2011년과 비교하여 2014년, 2017년, 2020년의 노인학대 피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기간 효과는 개인 특성에 따른 영향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부표 2 참조).
Ⅴ. 결론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에 대한 추세,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노인학대의 전반적인 피해경험률은 최근 10년간 43.3%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재엽 외(2010)와 김정혜 외(2022)의 연구에서 배우자 폭력은 2010년 40.7%에서 2022년 25.8%로, 배우자 폭력을 제외한 기타 가족원의 노인학대 피해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4.1%로 크게 낮아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매년 발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2011년 3,441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2, 202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증가 추세는 언뜻 보면, 본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즉 두 개의 자료는 표본이 다르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증가는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의 증가가 아닌, 노인인구 수의 절대적인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연동된 노인학대 판정건수 증가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대유형별로 추이를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간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16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 경제적 방임은 9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신체적 방임 78.6%, 경제적 학대 73.3%, 정서적 학대가 30.3% 감소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피해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인학대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체적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덜 심각한 유형의 노인학대는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보다 심각한 유형의 노인학대인 신체적 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한 학대행위자 분포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녀의 비중이 줄고 친구·이웃의 비율이 증가한 점이다. 특히 신체적 학대행위자 중 친구·이웃의 비율이 2011년에 비해 2020년에는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가족이라는 기존 연구와는 대조를 이루는 결과이다. 학대행위자 중 친구·이웃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드는 반면, 친구·이웃과 상호작용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학대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친구·이웃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지만 친구·이웃 등 타인에 의한 학대는 가족에 비해 학대의 심각성이 낮거나 관계를 절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친구·이웃 학대행위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하여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에서 유의하게 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았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구조와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인권의식의 확산,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빈곤율 감소, 공적 돌봄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인해 기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주된 학대행위자인 자녀와 동거하면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자녀 동거가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자녀가 학대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및 수급자 확산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감소하여 노인학대 발생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인권감수성의 증가(정진성 외, 2014)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의 결과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쇠약해지면서 의존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 피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보장제도 및 공적 노인돌봄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의존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 그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연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코호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현재 노인 세대가 아직은 노부모 부양문화나 가족 중심 돌봄 체계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어서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가 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코호트 효과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다른 자료(가정폭력실태조사 등)를 통해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코호트 효과 검증을 재연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이웃이 행하는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주요 행위자로 친구·이웃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2015년 7월 상주농약사건, 2016년 3월 청송농약소주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박지현, 정은숙, 2019), 친구·이웃이 행하는 노인학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친구·이웃의 학대 비율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이런 차이는 노인의 생활공간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친구·이웃 간의 갈등과 학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은 친구·이웃이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노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신체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 학대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학대피해를 받는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동거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피해를 받게 되면,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노인학대 피해쉼터에서 4개월(추가 2개월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는데, 거주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여 노인학대를 중지·예방시켜야 한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7.3%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2020년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에 반영해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약 62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총 21,936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7,025건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72.2명이며 전체 노인인구의 0.07%에 불과하다. 실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의 규모에 비해 신고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학대 피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학대가 은폐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은폐된 사례를 발굴하여 노인학대를 중지·예방시킬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발견된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기간 효과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예방 캠페인(예: 2019년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전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점점 확산되어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점점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격히 증가하는 학대사례 건수에 비해 더디게 확충되고 있다. 2005년∼2023년 학대사례건수는 약 3.5배 증가하였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은 2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인프라의 확충 수준도 미비하다. 예를 들면 2025년 아동인구는 약 525만 명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95개에 달하는 데 반하여, 노인인구는 아동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000만 명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작 36개에 불과하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것처럼 시군구별로 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의 기간효과에서 보듯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와 공적 노인돌봄제도의 확충 등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 노인학대 발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은 학대 발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부담은 노인학대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돌봄제도의 개선 역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각각의 조사 시점에서 설문 문항이 추가되거나 배제되어 공통으로 해당하는 설문 문항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의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방임, 경제적 방임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성적 학대는 2011년과 2014년은 설문 문항에서 제외되었고 2017년과 2020년에 추가된 문항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도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구조, 건강상태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연령대별로 구분한 코호트 방식에는 해석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코호트 내 하위 집단(예: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력 등)에 따른 학대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코호트를 단일 출생연도군이 아닌 생활주기와 사회적 경험의 궤적으로 재정의하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설 거주자 및 고위험군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한 노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통계와 본 연구 결과 간 괴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한계로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만 파악할 수 있었고, 학대피해노인의 수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보다 심도깊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변수가 없어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2차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친구·이웃인 경우, 발생장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학대의 원인 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대발생 장소에 대한 양적 자료가 집적되어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친구·이웃의 학대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이들이 학대를 행하게 되는 원인 및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2024). 노인복지법. 2024. 2. 4. 검색,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subMenuId=15#undefined
. (2025). 노인복지법. 2025. 4. 25. 검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 (2023). 노인빈곤율. 2023. 12. 11. 검색,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7
, , , & (1996). The association of elder abuse and substance abuse in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The Gerontologist, 36(5), 694-700. [PubMed]
, , , , &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4), 469-474. [PubMed]
, , , & (2017). Elder abuse prevalence in community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Glob Health, e147-e156. [PubMed]
부록
부표 1.
노인학대 피해경험자가 경험한 학대유형의 빈도 및 비율
| (단위: 명, %) | |||||||
|---|---|---|---|---|---|---|---|
| 구분 | 2011년 (n=1,332) | 2014년 (n=1,019) | 2017년 (n=990) | 2020년 (n=716) | 계 (n=4,057) | 통계량 (χ2) | p |
| 신체적 학대 | 50(3.8) | 15(1.5) | 34(3.4) | 131(18.3) | 230(5.7) | 143.650*** | .000 |
| 정서적 학대 | 988(74.2) | 749(73.5) | 741(74.8) | 653(91.2) | 3,131(77.2) | 65.004*** | .000 |
| 경제적 학대 | 153(11.5) | 32(3.1) | 41(4.1) | 37(5.2) | 263(6.5) | 146.276*** | .000 |
| 신체적 방임 | 144(10.8) | 157(15.4) | 168(17.0) | 27(3.8) | 496(12.2) | 101.219*** | .000 |
| 경제적 방임 | 258(19.4) | 284(27.9) | 232(23.4) | 23(3.2) | 797(19.6) | 209.123*** | .000 |
부표 2
기간 효과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 분류 | 변수 | B | SE | Wald | p | Exp(B) |
|---|---|---|---|---|---|---|
| 기간 | 기간(2014=1, 2011=0) | -.353 | .045 | 60.234 | .000 | .703*** |
| 기간(2017=1, 2011=0) | -.271 | .046 | 34.569 | .000 | .762*** | |
| 기간(2020=1, 2011=0) | -.386 | .052 | 55.609 | .000 | .680*** | |
| 노인개인 특성 | 성별(남성=1, 여성=0) | .102 | .039 | 6.697 | .010 | 1.107* |
| 교육수준(초졸=1, 무학=0) | -.088 | .046 | 3.691 | .055 | .916 | |
| 교육수준(중졸=1, 무학=0) | -.093 | .060 | 2.426 | .119 | .911 | |
| 교육수준(고졸이상=1, 무학=0) | .086 | .056 | 2.352 | .125 | 1.090 | |
| 지역(동부=1, 읍=0) | .136 | .041 | 11.187 | .001 | 1.145 | |
| 가구형태 (노인단독=1, 노인부부=0) | .299 | .046 | 42.578 | .000 | 1.349*** | |
| 가구형태 (자녀동거=1, 노인부부=0) | .145 | .044 | 10.812 | .001 | 1.156** | |
| 가구형태 (기타=1, 노인부부=0) | .203 | .087 | 5.399 | .020 | 1.225* | |
| 경제활동(예=1, 아니오=0) | .343 | .039 | 77.486 | .000 | 1.409***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1, 아니오=0) | .480 | .061 | 61.397 | .000 | 1.615*** | |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1, 건강함=0) | -.072 | .043 | 2.718 | .099 | .931 | |
| 자가유무(있음=1, 없음=0) | -.173 | .039 | 19.355 | .000 | .841*** | |
| 만성질환 수 | .084 | .010 | 64.235 | .000 | 1.088*** | |
| 인지기능 | .011 | .006 | 3.297 | .069 | 1.011 | |
| 우울 | .087 | .004 | 400.880 | .000 | 1.091*** | |
| 가족 및 친척 수 | -.071 | .012 | 34.537 | .000 | .932*** | |
| 상수항 | -2.982 | .137 | 472.119 | .000 | .051*** | |
| 분류의 정확도 | 90.1% | |||||
| χ2 | 1269.144*** | |||||
| -2 Log likelihood | 25147.883 | |||||
| Nagelkerke R2 | .064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0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07

- 761Download
- 271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