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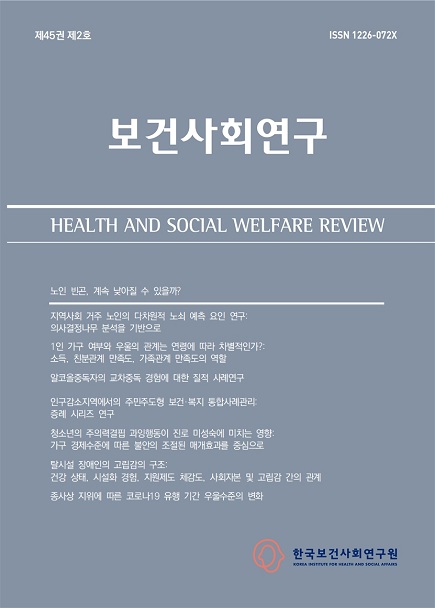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다부문 협력: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시사점
Multisectoral Collabora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sights from Neighborhood-Level Health Promotion
Heo, Hyun-Hee1; Lee, Yein2; Nam, Man Seok3; Choi, Minhyeok4; Yoon, Taeho4*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352-376,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35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보건과 복지의 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일부 지역이나 고령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통합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미시적 수준에서는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협력의 후순위화가 문제로, 이를 위해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였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형식적 협의체 운영이 문제로, 전문직 간 위계와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 요구되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 연계 부족과 운영 지침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본 보건복지 통합의 과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소지역 보건기능의 강화, 인구집단 기반 접근이다. 향후, 제한된 통합지원대상자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지역보건과 지역복지 통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barriers,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within neighborhood-level health promotion progra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key stakeholders who had experience with local health and social welfare initiatives. Thematic analysis was applied to the transcribed data,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Care” proposed by Valentijn and colleagues to support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service integr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tegration within health promotion programs operates as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across micro (practice), meso (organizational), and macro (systemic) levels, with each level encompassing both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At the micro level, excessive workloads and the deprioritization of collaboration emerged as key barriers, indicating a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cross-sectoral collaboration capacities. At the meso level, unclear professional roles and the tokenistic operation of the coalition were major challenges, requiring the mitigation of hierarchical and cultural divides between professionals and the activa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absence of operational guidelines were critical obstacl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sustained policy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effectively integrate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t is essential to promote community engagement, strengthen neighborhood-level health functions, and adopt a population-based approach. Multisectoral collabora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structural challenges of integration.
초록
본 연구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의 현황, 저해 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소지역 건강 및 복지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주제 분석하였다. 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 발렌틴 외의 ‘통합돌봄 개념틀’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증진사업 내 통합은 미시적(실천현장), 중간, 거시적(제도) 수준에서 다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각 차원은 통합의 저해 및 촉진 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협력의 후순위화가 장애요인으로,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중간 수준 에서는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문제였으며, 전문직 간 위계와 문화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 요구되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 연계 부족과 운영 지침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측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 소지역 보건기능의 강화, 인구집단에 기반한 접근이 강조되며, 통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보건과 복지 부문 간의 조정과 협력은 오랜 관심사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감염병 범유행의 잦은 위협이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 부문 간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 음식, 소득, 교통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은 건강과 건강불평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WHO, 2008).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사회서비스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제공된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2019). 따라서,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겪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은 단순히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넘어 보건과 복지 분야 고유의 전문성과 강점을 유지하고, 두 부문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으로 주목 받아왔다.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통합(일반적으로 다부문 통합)을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공식적인 학설은 비교적 드물지만, 통합은 덜 관여하는 형태인 조정(coordination) 및 협력(collaboration)에서 더 관여하는 형태인 전체 조직 통합 (full organizational integration)으로 이어지는 연속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Fichtenberg et al., 2020). 국내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 통합의 다양한 스펙트럼 내에서 정책적 노력을 쏟았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과 복지의 물리적 통합을 도모하였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2012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지난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속되고 있다. 살던 지역에서 나이듦(Aging in Place: AIP)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그로 인해 제도적 논의와 예산 지원이 축소되었지만,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분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앞서 제도적, 실천적 세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내 보건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과 한계점이 드러났다. 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물리적 통합에 그쳐 실패로 귀결되었으며(이봉주, 2005), 이후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의 단점을 개선하여 시도된 사례관리 중심 모형의 희망복지지원단 역시 인력 및 업무 분담 문제, 주무 부처의 제한적 지원, 접근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김근혜, 2016). 이러한 경험은 통합서비스가 물리적 구조나 법적 기반의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협력 체계와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보건복지 통합 및 전달체계를 다룬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직 간 갈등, 역할 중복과 비효율, 정보 및 연계 부족 등 현장 실행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요인을 지적하고 있다(김일호 외, 2024; 민소영, 2022; 정재연, 남석인, 2024).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취약계층의 사례관리 등 복지전달체계 관점에서 서비스 통합을 논의하거나, 서울 등 특정 지역 사례에 국한된 연구가 많아 전체 인구 집단 대상의 보건복지 통합 시도의 맥락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사회적 결정요인의 위험을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Fichtenberg et al., 2020). 영국은 NHS의 보건복지 통합사례와 사회적 처방사업을 통해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와 비의료적 접근(사회서비스)이 긴밀히 연계될 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강창현, 2013; 허현희, 2022). 이러한 논의는 보건의료 안전망이 소득, 주거, 교육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하는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을 통해 드러난 보건복지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과 제도적 차원의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의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사업에서 통합의 수준과 형태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Fleming et al.,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지역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현황과 도전 과제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읍면동은 지리적 경계가 분명하고 행정 체계와 일치하며, 주민들의 삶의 터와 밀착되어 지역의 건강 문제와 주민의 건강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공공 및 민간 지역자원을 활용해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이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따라 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인 부산의 마을건강센터사업 등도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설치되어 실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역시 읍면동을 기본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보건복지 통합을 연구하는데 읍면동의 범위는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분석 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 통합을 다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지역 단위의 건강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 현황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통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주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한 문헌이 대부분이며, 건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일부 지역이나 고령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통합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지역 단위 건강사업 또는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수준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으로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1)보건복지 통합의 현황을 조사하고, 2)보건 복지 통합의 저해요인과 3)보건복지 통합의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지역건강사업에서 보건복지통합의 필요성
지역 내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보건 및 사회적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개별적 접근만으로는 주민의 건강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강양화, 박수정, 2024; Reed et al., 2021). 또한, 노인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정재연, 남석인, 2024).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사회적 요구, 예를 들어 주거, 식량, 소득, 교통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leming et al., 2023).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 통합의 필요성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증진 효과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과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노인 인구의 경우,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지만 연계 부족으로 인해 재활과 회복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남은우 외, 2020). 이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엄진영 외, 2015),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최권호 외, 2022). 또한, 지역사회 복지 인력과 건강관리 인력 간의 협력은 대상자가 예방적 의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돕고,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el et al., 2022).
보건복지통합은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가 인식하는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xter et al., 2018).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례관리는 전문 영역에 한정되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의 사례관리 프로세스와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재연, 남석인, 2024).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보건의료 기관과 다른 분야 간의 협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공동 스폰서십과 같은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ewster et al., 2019). 마지막으로,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는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의 요구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엄원자, 2004), 보건과 복지 분야는 상호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김일호 외, 2024).
따라서, 지역건강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증진 효과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이 필수적이다.
2. 지역건강사업에서 보건복지통합의 현황
해외 국가들은 통합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통합을 장기적인 정책 우선 순위로 삼으며(Reed et al., 2021), 통합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증가시키고 있다(Baxter et al., 2018). 일본은 의료적 치료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노인의 요구에 맞춰 누락없이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임정미, 2018), 스웨덴 최초의 통합케어 사례인 노르텔예 모델(Norrtälje model)은 복잡한 요구를 가진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에게 통합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조직과 단일 예산 체계의 운영을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Bäck & Calltorp, 2015).
국내 보건과 복지 전반에 걸친 시도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연계 운영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은 조직적 통합을 강조하여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행정적 전략 모형과, 기능적 통합을 강조하여 담당자나 기관의 능력과 운영에 중점을 두는 사례관리 중심 모형으로 구분된다(김근혜, 윤은기, 2017). 행정적 전략 모형의 대표적인 시도는 1995년에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공간적·물리적 통합을 통해 서비스 체계 단일화를 시도한 보건복지사무소이다(이은경, 2010a).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기관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단편적인 개별 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이현송, 강혜규, 1997). 사례관리 중심 모형의 대표적인 시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 회의 시 가급적 보건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시작하여(채현탁, 2016), 현재,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보건과 복지의 지역단위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5). 행정적 전략 모형과 사례관리 중심 모형이 혼합된 형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체계이다(보건복지부, 2018). 이 과정에서 보건, 복지,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였으나, 다양한 협력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정재연, 남석인, 2024).
국내 지역건강사업에서 사용되는 보건복지통합의 형태는 보건소 중심 통합, 협의체 기반 통합, 주민자치조직 기반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소 중심 통합은 경남권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하고, 사업 대상에 맞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방문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양화, 박수정, 2024).
협의체 기반 협력의 예시는 부산의 건강반송사업, 마을건강센터 사업 및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반송사업은 해운대구 보건소, 반송지역의 4개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단체, 연구진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반송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주민, 보건, 복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변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윤태호, 2024). 마을건강센터 사업에서는 주민(과반 이상), 보건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이 함께 마을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 문제와 복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 학계,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자 서비스 연계, 자원 개발, 자문 및 평가를 활성화시켰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주민자치 기반의 통합적 접근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홍남수, 김건엽, 2023). 이 연구에서는 보건과 주민자치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마을 단위의 통합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간의 협력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중심성이 확보될 때,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복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 지역건강사업에서 보건복지통합의 과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문은 각기 다른 사명, 기관, 전문적 역할, 그리고 자원의 분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통합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Fleming et al., 2023). 국내외 보건복지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첫째, 문화적 어려움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자의 지원부족이 포함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건과 사회복지 부문 간 상호 이해 부족이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김미주, 이인수, 2007; 엄원자, 2004; 정재연, 남석인, 2024), 특히 조직 문화, 업무 관행,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통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de Matos et al., 2024). 이은경(2022)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건강의 사회적 모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자의 지원부족은 역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큰 장애요인으로 보건과 복지기관의 계층적 구조에서 관리자의 의지와 관심이 직원 만족도에 직결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계 서비스를 위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조직 환경이 필요하다(김근혜, 윤은기, 2017).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통합의 어려움은 분절된 서비스 전달 체계와 조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서울시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비교 한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일본에 비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간 연계가 미흡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이 물리적·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절실하다는 점이 지적하였다(남은우 외, 2020). 김일호 외(2024)는 우리나라또한 국내 돌봄 관련 정보시스템의 다원화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일호 외, 2024). 행정 체계의 복잡성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리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de Matos et al., 2024). 통합의 물리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사회복 지사 간의 공간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며, 이는 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이를 위해 물리적 근접성과 상호 의존성 인식 기반의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김미주, 2008). 이은경(2010b)은 재정 분리가 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렵게 만든다(de Matos et al., 2024). 분절된 체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전담할 조직 또는 인력의 배치(김근혜, 윤은기, 2017; 엄원자, 2004; 이은경, 2022), 통합재정방식 도입(이은경, 2010b), 보건복지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등 기술적 방안이 제시되었다(서동희, 김좌겸, 2019).
또한, 조직간 역할의 불명확성이 보건복지통합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김미주, 이인수, 2007; 김일호 외, 2024). 이에 대해 전용호(2018)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보건, 복지 간 연계와 조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영국의 보건복지 통합정책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건과 복지 간 업무 영역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과를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은경, 2010b).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어려움으로 법과 지침의 부재,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 자원의 제한이 포함된다. 보건복지통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미비해 실제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도 반영되어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공무원들의 업무는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만, 중앙정부의 법과 지침에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요구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만 다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전용호, 2018). 이에 반해 영국은 사회서비스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도화하고 있어, 국내도 유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이은경, 2010b; 김근혜, 윤은기, 2017).
또한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보건복지통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실천 현장은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고려 없이 비현실적인 통합을 강요하거나 실무자가 배제된 하향식 통합이 진행되었다(정재연, 남석인, 2024). 실무자들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통합은 명확한 방향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는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없고, 현장의 요구와 괴리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장기적인 통합서비스 계획을 방해하며, 기관간의 신뢰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meron et al., 201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과 최적의 서비스 시간 간에는 차이가 있어 비용효과성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예산을 통해 서비스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엄진영 외, 20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확대와 재정지원 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김근혜, 윤은기, 2017).
4. 보건복지통합에 대한 이론적 개념
보건복지통합은 단순한 기관 간 협업을 넘어,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재정, 인력, 정보 체계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통합접근을 의미한다(Kodner & Spreeuwenberg, 2002). 보건복지 통합은 그 수준 (level)과 유형(type)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Leutz(1999)는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합이라 정리하고, 서비스 통합의 단계를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으로 구분하였다. 연계는 기관 간 협력은 이루어지고 운영과 기준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이며, 조정은 사례관리나 통합 기록체계를 통해 협력을 구조화하고 연속성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완전통합은 자원과 재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단일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의미한다. Butterfoss(2007)는 기관 간 협력의 강도와 형태에 따라 통합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소통(networking)은 상호이익을 위한 정보교류 등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인 협력관계이며, 협조(cooperating)는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공식 협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조정(coordinating)은 특정 목표나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공식적인 협력관계이며, 협력(collaborating)은 독립적인 기관들이 공동의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Valentijn 외(2013)는 보건복지 통합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통합을 미시적(micro), 중간(meso), 거시적(macro)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그림1). 미시적 수준에서는 환자 중심의 임상 통합(clinical integration),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및 조직 간 통합(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적·재정적 통합(system integration)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미시적 수준에서의 통합은 개별 환자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가 시간, 장소, 전문 분야를 넘나들며 조정되는 것이다. 중간 수준의 통합은 서로 다른 조직 간 통합과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거시 수준의 통합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책, 규칙, 구조 등을 정렬하여 인구 전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수직적 통합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는 수평적 통합으로 분류된다. 또한, 미시적, 중간, 거시적 수준의 연결은 운영 기반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과 공유된 가치 기반의 규범적 통합(Normative Integration)을 통해 차원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림 1
통합돌봄의 개념틀
출처: “Understanding integrated care: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integrative functions of primary care”, Valentijn et al., 2013, 저자 번역.
본 연구는 지역기반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Valentijn 외(2013)의 모델을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통합을 단일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실천 임상 현장, 조직, 시스템 등 다차원적이고 계층화된 구조로 설명하며, 특히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접근과 정책·조직적 통합의 상호작용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틀은 돌봄 연속성(care continuum)을 강조하며, 공중 보건의 핵심 전략인 일차 의료 관점에서 보건복지통합 차원을 결합한 포괄적 틀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다양한 통합의 차원과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탐색하여 통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현황과 한계점을 조사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보건복지 연계와 협력을 실행하고 있는 소지역 단위 건강증진사업 현장의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 자료는 다양한 정부 수준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심층 면접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목적에 따라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 현황과 과제에 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key knowledgeables)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Patton, 2015). 참여자 선정을 위해 소지역 건강증진과 연관된 연구와 사업을 10년 이상 관여해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 6인의 추천(repuational sampling)을 받았다. 소개받은 대상자에게 미리 전화 및 메일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알리고 심층면접 참여의사를 물은 뒤 승낙하는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심층 면접 당일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소지역 건강증진사업 또는 소지역 복지사업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이거나 직접 주민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소지역 사업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 최근 3년 동안 6개월 미만 소지역 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사업 참여 경험이 있으며, (2) 1년 미만 진행된 단기 소지역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정부 수준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지역보건 및 지역복지 기관에 속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보건소와 소지역 보건기관, 행정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골고루 안배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했다. 또 현재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수도권(도시)과 비수도권(농촌, 도농 혼합)의 마을건강위원회 위원장 3명을 모집했다.
본 연구 참여자로 중앙정부 관계자(2명), 보건소장 및 소지역 보건기관 담당자(4명), 읍면동 복지사업 담당 인력(2명), 건강사업 참여 주민(3명) 등 총 11명의 이해관계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분석에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표1)을 살펴보면, 읍면동 지자체 수준에서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이 7명, 시군구 지자체 수준에서 참여한 공무원이 2명, 중앙정부 수준에서 참여한 공무원이 1명이었다. 관할 지역을 살펴보면, 비수도권(5명), 수도권(4명), 전국(1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가 속한 영역과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 공무원은 4명, 복지 분야 공무원은 3명, 주민은 3명이었다.
표 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특성
| 정부 수준 | 소속 기관/단체 | 직위/역할 | 지역 | 구분 |
|---|---|---|---|---|
| 지자체(읍면동) | 마을건강위원회 | 건강위원회 위원장 | 경북 군지역 | 주민1 |
| 건강위원회 위원장 | 경남 시지역 | 주민2 | ||
| 건강위원회 위원장 | 서울 구지역 | 주민3 | ||
| 행정복지센터 | 사무장 | 부산 구지역 | 복지1 | |
| 주무관 | 서울 구지역 | 복지2 | ||
| 마을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 계장 | 부산 구지역 | 보건1 | |
| 보건지소 | 팀장 | 서울 구지역 | 보건2 | |
| 지자체(시군구) | 보건소 | 소장 | 경남 시지역 | 보건3 |
| 소장 | 서울 구지역 | 보건4 | ||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정책 실무책임자 | 전국 | 복지3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심층 면접은 미리 면접 계획을 세우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적 자료는 2023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소지역 건강증진사업 또는 소지역 복지사업을 기획, 운영, 평가하거나 직접 주민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회의실, 마을 공유 공간 등 조용한 단독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작성된 반구조화 질문 항목은 학계 및 소지역 사업의 현장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여 도출했다. 주요 질문 영역은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지역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자는 세부적인 질문으로 1) 소지역 건강증진사업과 복지사업의 협력 경험과 수준, 2) 협력의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 3) 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며, 인터뷰 상황에 따라 심층 질문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행하였다(과제번호: PNU IRB/2023_139_HR).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녹음하였고 모두 전사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항목은 익명 처리해 분석에 사용했다. 전사 자료는 녹음파일,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의 확인 등과 대조하여 검토 진행했고, 확인된 녹취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에 입력하여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하였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의 목적은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기관(단체)의 활동 현황과 통합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의 진술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채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녹취록을 면밀히 읽으면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구분되는 정보를 추출해 분류하였고, 분류된 진술들에 연구진은 내용을 요약하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코드들은 관련된 주제별로 묶고 상위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이 귀납적 주제분석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구자 간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별로 분류된 코드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이론적 분류를 연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론적 분류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Care)을 활용하였다(Valentijn et al., 2013).
모든 분석 과정은 다년간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팀을 이루어 지속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상호 검증하였다(Cohen & Crabtree, 2008). 분석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 연구 참여자와 실무자의 확인 과정을 진행하는 등 삼각검증 접근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IV. 연구 결과
1.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 현황
가. 소지역 단위 보건복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연구 참여자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건강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보건·복지 사업 연계의 필요도는 높아졌다. 소지역 기반으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은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건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끼리 방문을 갔다가 긴급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무실에 전화하면 우리 방문간호 선생님이 동네니까 바로 와서 같이 대응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았던 거 같고요.(중략) 별도 권역별로 뭘 만든다든 지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최일선 현장인 여기(동주민센터)에 보건과 복지가 같이 있는 것이 협조하기도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편리하기도 하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가고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끝나기 때문에…” - 복지2, 수도권
나. 주민건강위원회의 소지역 단위 다부문 협력 촉진 역할
소지역 기반의 보건·복지 연계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외롭지 않게 나이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접근으로 드러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의 마을건강위원회 위원장은 노년이 되어서도 익숙한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 없이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심정을 “동네에서 고독사하는 노인이 있는 마을이 무슨 공동체예요”라고 표현했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조직인 건강위원회는 보건복지 통합을 추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마을건강위원회는 소득 수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긴급한 가정인데 수급자도 아니었고 (가족 중) 장기요양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미성년이고 그 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요. 행정에서 나와서 보더라도 긴급 돌봄 도시락 넣어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보호자가 제대로 알고 다 챙겨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진짜로 열악하신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중략) 00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파킨슨병 진단 받는 과정을 도와드렸고, 그 다음 수급 신청하고 이런 것도 계속 동주민센터에 요청해서 도와드렸어요. (중략) 어쨌든 고립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아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주민3, 수도권
“면사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어려운 이웃 발굴해서 지원도 잘 해주고 이랬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서 탈락해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아우트라인을 딱 정해 놔가지고,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바람에 안되고, 아들, 딸이 있어서 안 된다는 등 이래 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편하거든. 그래서 건강위원회는 거기서 다 누락된 사람들을 한 번 더 챙겨보자. 사업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팀장님은 우리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하고요. 행정복지센터장, 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달라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주민2, 비수도권
2.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저해 요인
가. 보건 및 복지 분야 간 행정 칸막이와 이원화
공공전달체계 내 보건과 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통합을 위한 법과 지침이 부족하고, 업무의 결재 라인이 분리되어 있는 점을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보건소가 시군구청 소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외청으로 인식하는 시군구 복지 담당자들이 많아 협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면서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지만, 여전히 구청 직원들은 보건소 인력에 대해 별개의 조직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앙 정부의 지역복지 담당자부터 주민과 밀접한 최일선의 지방 행정 실행 단위인 동주민센터의 동복지 담당자까지 공유하고 있어 보건복지 행정 칸막이 현상은 모든 정부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물리적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 직종의 인력이라도 소속 기관이 다를 경우 조정과 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간호 인력은 동주민센터 소속이고, 마을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으로 파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시와 결재를 받는 라인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례 관리에 대한 실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동일 대상자에 대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 현장에서의 업무 과부하와 협력 우선 순위 미루기
기초지자체 동복지 담당자들은 지역복지행정 정책에 따른 세부 사업을 실행하는 최일선의 인력으로서 업무의 과부하와 그로 인한 높은 피로도를 호소했고, 중앙정부의 지역복지정책 담당자는 지역복지 업무의 분절화 문제를 지적해 정부 수준에 따른 다른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 인력의 역량 차이가 커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수준에서 보건복지 연계 사업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역별 인력자원의 불균형 문제도 거론되었다. 동복지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과부하 인식과 다부문 협력 역량 부족은 동복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보건 인력과의 협업을 우선 순위에서 미루거나 피하고 싶게 하는 요인이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인력 역시 내부 업무의 피로도와 업무의 분절화를 경험하고 있어 협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일반 행정과 나머지 복지 행정 간의 갈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복지 영역) 내에서의 두 팀(찾아가는 복지팀과 복지행정팀)도 역할 갈등이 많아요. (중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 파트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일조차도 힘들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건과의 연계 부분까지는 좀 더 요원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복지3, 전국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동사례관리라는 용어도 나오고 협업을 하라 하고 그래서 조금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동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건강 빼고 찾아가는 사례 업무만 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보건이 추가되니까 건강 업무는 마을건강센터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죠.” - 복지1, 비수도권
“방문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라인이 2개인 거잖아요. 동주민센터도 있고 보건소에 또 다른 라인이 있죠. 근데 보건지소(소지역 보건기관)에서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와서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라인이 3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방문간호사 입장에서는 일도 너무 많은데, 눈치 봐야 될 라인도 너무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은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 분들에 대해 이해는 가요. 동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 동장님이나 팀장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보건소 소속이니까 또 눈치를 보게 되고요. (보건2, 수도권)
다.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자원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진술했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관점에서 보면, 구성원 중 주민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지역 관변단체 위주의 인원수 맞추기식 참여가 많았다. 협의체 운영은 본래의 목적인 통합사례회의가 아닌 역량강화 교육이나 힐링 프로그램 제공 등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조정과 통합을 위한 직접 서비스 인력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의 책임과 역할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동복지 업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는 업무는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가 낮아져 직급이나 연차가 낮은 복지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라. 전문직 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문화적 갈등
읍면동 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업무 및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업 초기 갈등을 겪었다. 동복지 담당자들은 적극적인 임상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소속의 방문간호사와 달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보건소 파견 방문간호사들은 동일 직종이지만 소속과 위계가 다른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신분 차이가 협업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간호사와 달리, 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에 대해 동사무소의 공식적 활동이나 회식에 초대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건복지 통합에 관한 제도적 지원 부족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틀어서 모두 보건복지 통합에 관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읍면동 복지 현장 실무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보건 영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부 지침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소와 구청은 지역보건복지 사업 중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기관과 복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민간 보건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제도가 부족한 것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광역 지자체 수준의 보건복지 통합은 선출직 지자체장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자체의 리더십 교체가 되면 보건복지 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축소되거나 끊기는 경우가 많아 정책 지속성의 한계가 나타났다.
“행정적인 업무로 보자면 동에서 건강 업무까지 하는데 동 기능에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동장님이 4급이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요구하겠죠. (중략) 건강까지 들어온다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동장 역할에 엄청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서로 안 원할 것 같아요. (중략) 건강 사례관리를 해라, 공동 사례관리를 해라 제목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매뉴얼인 거지요.” - 복지1, 비수도권
3.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 활성화 요인
가. 보건복지 통합에 관한 상위 정부 차원의 소통기전 마련
보건복지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상위 정부 차원의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므로 보건복지 조정과 통합에 관한 상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보건복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역할과 상대 분야의 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와 이해가 낮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상위 법령과 지침의 영향력이 큰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역 복지 관련 법과 계획을 지역보건 영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위 정부 단위의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을 위한 세부 지침을 개발해 실행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보건복지가 통합돌봄으로 가려면 중앙부처에서도 그게 상시화 되어야 해요. 건강정책과나 공공의료 파트에서 복지를 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는 같은 팀, 원 팀이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결국은 밑에 와도 똑같이 전달되거든요.” -보건3, 비수도권
나. 보건·복지 인력의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
소지역 기반 보건복지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와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하, ‘주공사업’)에 참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은 상대 분야의 역할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실행하는 동복지 담당자들은 신규 간호 인력에 비해 동 주민센터 업무에 익숙한 상황인데 반해, 신규 간호 인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현장 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된 신규 간호 인력과 동복지 담당자의 협력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읍면동 주민센터의 지역복지팀과 함께 사례관리를 했던 경험이 많은 보건소 소속의 방문 간호사와 마을건강센터의 간호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통합에 대해 익숙한 경우가 많았다. 질적연구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일부 마을건강센터의 마을간호사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의 신규 채용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동복지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돕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 인력들이 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중심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중략) 융합적으로 잘 가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보건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복지2, 수도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마을건강센터 간호사)가 막 했거든요. 간호직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의 간호사)한테 가르치고 불러서 지침도 가르치고 복지가 너무 바빠서 일을 못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가 불러 시스템 쓰는 거랑 공문 만드는 거랑 이거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간호사) 이런 걸로 힘들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해줬어요. 그럼 거기서(사회복지사) 그거는 이래서 저렇고 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전달해줘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 보건1, 비수도권
소지역 단위 보건복지 인력의 다부문 협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보다 상위 행정 단위인 시군구 수준의 보건-복지-행정이 연계하는 다부문 협력 지원이 중요했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공공전달체계에 속해 있는 보건복지 인력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규범적, 구조적 협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즉, 기초지자체의 상위 정부 단위에서 보건복지 조직의 문화와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운영하거나, 상대 기관에 교차 파견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난이도가 높은 복합사례관리를 공동 해결하면서 역량을 쌓아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 소지역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다부문 협의체 활성화
읍면동 단위의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위기가구 사례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 지역구에서는 보건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소생활 권역별로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주민건강활동가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다부문 협력 협의체를 구현하고 있어 사례 발굴과 관리, 사후관리까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은 소지역 기반의 정기적인 협의체 모임을 통해 보건복지 담당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상대방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라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지역 기반의 보건복지 연계가 전보다 원활해졌다고 언급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원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동 주민센터,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모여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시스템이라도 좋겠고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례가 생겼을 때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 주민3, 수도권
“정신질환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위협했을 때 사회복지팀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권역사례회의 때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보는 거죠. 원래 경찰이 오는 게 맞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이 있는 거니까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경찰이 오든 누가 오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나오겠대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공무원) 개인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는데 권역사례회의에서 하니까. 권역별 담당이 모두 생겼으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라포가 있고 하니까 그 담당자들끼리 협력하게 되잖아요. 회의에는 지역 건강활동가까지 다 참석해요.” - 보건4, 수도권
4.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구조적 이해
질적 자료의 주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저해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Valentijn 외(2013)의 분석틀을 활용해 미시적 수준, 중간 수준, 거시적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분류하였다(표 2).
표 2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의 구조적 이해
| 구분 | 차원 | 저해 요인 | 활성화 요인 |
|---|---|---|---|
| 미시적 수준 (Micro level) | 실천 현장에서 통합 | ||
| 중간 수준 (Meso level) | 전문직 간 통합 | ||
| 조직 간 통합 | |||
| 거시적 수준 (Macro level) | 체계 간 통합 |
미시적 수준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실천 현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통합서비스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와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 미흡으로 인해 협력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부문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교차 파견 및 사례 기반 협력 훈련 실시를 제시하였다. 통합돌봄의 개념적 틀에서 강조하는 사람 중심(Person-focused)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연속적이고 조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통합과 조직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결과, 역할의 불명확성과 문화적 갈등이 전문직 간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형식적 운영과 기관 간 통합 정보시스템의 미비가 조직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전문직 간 통합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통합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협의체 운영,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그리고 지역 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규범적, 기능적 통합 개념 모두와 연계될 수 있다. 즉, 전문직 간 소통을 통한 문화와 가치 공유, 정보 공유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조직과 전문가 간 협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체계 통합이 주요한 개념으로, 이는 정책 및 행정 차원에서 보건복지 통합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통합 지침 부재와 정책 지속성 부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단기적인 사업 종료가 반복되면서 장기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 지침 및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간 정례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추진단과 같은 상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규범적 통합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조직과 전문가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 및 통합을 위해서는 미시적(실천 현장 통합), 중간(전문직 및 조직 통합), 거시적 (체계 통합)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각 수준에서의 통합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및 규범적 통합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능적 통합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협업이 촉진될 수 있으며, 규범적 통합을 통해 조직 및 전문가 집단 간 공통된 가치와 목표가 정립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접근의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또는 복지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한계를 보인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보건사업과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질적 조사 결과, 소지역 단위 보건복지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지역 실천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건강위원회는 보건·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다부문 협력의 촉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단순히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로 나타났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보건복지 통합은 미시적, 중간, 거시적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차원은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의 저해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거시적 및 중간 수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미시적 수준의 실천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성을 보인다.
미시적 수준의 실천 현장에서 통합의 어려움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장의 과중한 업무와 협력을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현실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서의 전문직 간 역할 불명확성과 정책적 연계 부재가 실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관리자의 지원 부족은 실무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김근혜, 윤은기, 2017). 이와 더불어 보건과 복지 부문 간의 조직 문화, 의사소통 방식, 가치 차이 등 문화적 차이는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김미주, 이인수, 2007; de Matos et al., 2024). 이러한 차이는 실무자가 서로의 전문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협력 과정에서 신뢰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이은경, 2022). 따라서, 미시적 수준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상위 차원에서의 역할 명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전문직 간 공동 워크숍이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례화하고(NASEM, 2019), 관리자들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보건복지 현장에서 연계나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건과 복지 부문의 실무자나 관리자가 함께 교육을 받거나 소통을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건복지 통합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보건의 입장에서 복지와의 협력, 복지의 입장에서 보건과의 협력이 바라보는 각각의 교육 또는 훈련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 인력이 함께 하는 공동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 수준에서는 전문직 간 통합과 조직 간 통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전문직 간 갈등과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부재는 협력 구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이는 거시적 수준에서 통합된 지침 부재와 정책의 지속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간 수준에서의 활성화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핵심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민참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었다. 이는 기존의 보건복지 협력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조직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간의 역할,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관리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고, 서비스 대상자 역시 주민의 역할보다는 전문인력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취약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능동적 참여의 의미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민건강활동가를 포함한 보건복지통합협의체 운영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 공중보건 영역에서 주민 참여는 관료적 지시와 통제로 인한 사업 간 장벽과 중복적, 분절화된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태호(2024)는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 사례를 통해 단순히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건강실천활동과 같이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통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실질적 주민 참여는 소지역 보건복지 또는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마을 내 사회적 건강돌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허현희, 2022).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수준에서의 보건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현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간호사를 채용하여 보건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구조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 업무는 간호사 1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 통합이라기보다는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의 시대에서 소지역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시군구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읍면동 또는 소지역 수준의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연계 부족과 통합된 지침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다. 거시 수준의 장애요인인 보건과 복지 부문 간의 별개 지침과 행정 칸막이는 협력을 저해하며,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한계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민소영, 2022).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은 중간 및 미시적 수준에서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리더십 교체로 인한 정책의 비연속성이 지역 단위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예산 지원과 재정 지원 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통합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Cameron et al., 2014).
거시적 수준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명확한 통합 지침 마련과 법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중간 및 미시적 수준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구집단적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증진은 특정 돌봄이 필요한 집단이 아닌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은 전체 인구집단에 기반하여 돌봄에서의 협력과 조정,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성화, 예방과 불평등 감소 및 다양한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HS 장기계획을 2019년에 발표(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19)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병원서비스, 일차의료서비스, 공중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에 담긴 정책들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건돌봄법(Health and Care Act)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준에서는 보건과 복지의 협력과 통합이 체계화‧활성화되고 있고,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돌봄부장관(Minister of State for Care)을 신설하였다. 돌봄부장관은 성인사회서비스, 병원 및 지역사회 퇴원, 보건 사회서비스 통합, 치매, 일차의료, 지역사회보건, 장애 등으로 통합돌봄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4). 현행 통합돌봄 관련 업무가 보건정책실, 사회보장정책실,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조직체계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객관적인 일반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고,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맥락에서 보건복지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탐구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의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 조직 및 단체와 서비스 대상 주민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등과 협력하여 소지역 건강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 통합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주민이 건강증진과 통합돌봄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보건복지 통합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중간 수준의 조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시적 수준의 실천 현장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차원적 상호작용 구조를 보인다. 보건복지 통합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건강과 연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책과 법적 지침이 중간 수준의 조직적 통합을 지원하고, 이는 다시 미시적 수준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각 차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건강 증진과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건복지 통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에서 정의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 지원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앞둔 최근의 보건복지 통합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주로 이와 같은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돌봄통합지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에 대한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대상자로 진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 통합에 관한 논의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특정 위험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사업과 지역복지사업의 협력적‧통합적 실행을 다룬 실증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2023).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280
. (2004).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8155
.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침. https://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90&page_no=B2017003&board_idx=11019
, , , , & (2019). Collaboration in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networks for older adults: Association with health care utilization measures. Medical Care, 57(5), 327-333. [PubMed]
, , , & (2014). Factors that promote and hinder joint and integrated working between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A review of research literature.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2(3), 225-233. [PubMed]
, , , & (2024).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An umbrella review.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45(1), 14-29. [PubMed]
(2019). The NHS long term plan. https://www.longtermplan.nhs.uk
(2024). Ministerial role–Minister of State for Care. https://www.gov.uk/government/ministers/minister-of-state—182
, , , & (2020). Health And Human Services Integration: Generating Sustained Health And Equity Improvements. Health Affairs, 39(4), 567-573. [PubMed]
, , , , & (2023).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Boundary objects and cross-sector collabor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320, 115758. [PubMed]
, , , , , & (2021).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London, UK: Nuffield Trust. https://www.nuffieldtrust.org.uk/sites/default/files/2021-12/integrated-care-web.pdf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 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final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3943/9789241563703_eng.pdf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4-2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5-07

- 1730Download
- 4263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