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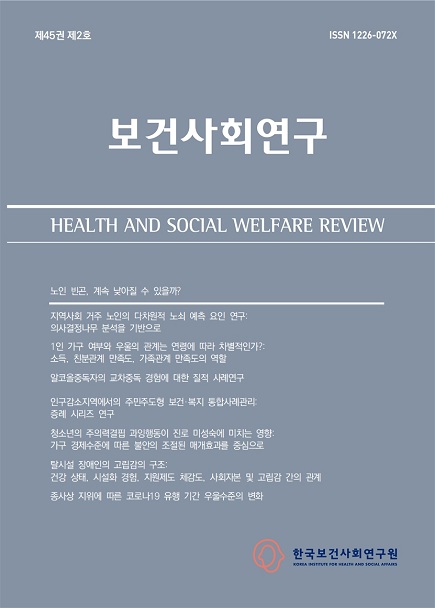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재발사건생존분석을 활용하여
The Effect of Parents’ Economic Support on Employment among NEET Youth: Recurrent Event Survival Analysis
Park, Jin Won1; Han, Chang-Keun1*
보건사회연구, Vol.45, No.2, pp.650-674, June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650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청년 니트(NEET)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중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직 과정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재발사건 생존분석을 활용한 분석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일수록 장기적으로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청년이 구직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직업 탐색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구직활동 수당 제공 등 구직 준비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지원제도가 부모 지원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한계를 개선하여 가구별 지원수준을 세분화한 차등적인 지원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Employment instability among youth is one of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 Training) youth. On the other hand, parental economic suppor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mong NEET youth by promoting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job sear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arental economic support on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employment among NEET youth, using data from the Youth Panel Survey (YP2007)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he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A 18.0.
The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 analysis showed a distinct divergence between the survival curves of the two groups based on economic support status at the 18-month mark, indicating that NEET youth receiving economic support had a higher likelihood of employment.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further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amount of economic support received.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rental financial support in the job search proces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aimed at promoting fair competition among youth.
초록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 Training, NEET)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인적 자본 축적과 직업 탐색을 촉진시켜 청년 니트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STATA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Kaplan-Meier 생존함수, Cox 비례 해저드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 결과, 18개월을 기점으로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곡선 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 집단이 더 높은 취업 확률을 보였다.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에서도 지원 금액이 클수록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 구직과정 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Ⅰ. 서론
1990년대 이전 청년들은 가족과 학교를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이 단선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랐다(Ashton & Field, 1976; Carter, 1962). 그러나 현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Furlong & Cartmel, 1997; 정준영, 2016).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구직 포기와 장기실업 상태를 나타내는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 Training, NEET)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정준영, 2016). 현재 니트는 전통적인 지표인 고용률이나 실업률보다 취업 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김기헌, 2024). OECD(2023)가 제시한 한국 니트 청년의 비율은 20.1%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의 정의1)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중등 후 교육 및 훈련 과정(formal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민간 직업 훈련기관이나 학원을 통해 교육 및 직업훈련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17.1%로 추정할 수 있다(김기헌, 2024). 하지만 이 수치 또한 2022년 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5%나 높은 수치이다. 이전 2018년 니트의 비율은 16.0%이었다는 점에서 청년 니트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년 앞에 놓인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기에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니트 상태에 놓인 청년의 특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니트로 이끄는지에 대한 니트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다. 반면, 청년 니트들이 어떻게 니트 상태를 탈출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즉 청년 니트의 취업요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청년 니트의 취업요인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청년 니트는 구직과정에서 장애물이 존재하고 구직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이 되었기에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 니트가 노동시장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박진원, 한창근, 2024).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개인 요인보다 가구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보호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할 때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2008년에는 14.7%였던 반면, 2021년 2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 외, 2016; 박원순 외, 2021).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진학률이 급증하였고 정규교육 이후에도 구직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등을 추가로 다니는 교육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Roksa & Levey, 2010; 이윤석, 2011) 오버 스펙 현상으로 인해 많은 청년은 취업준비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교육의 봄, 2024).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의 경제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교육과정이 끝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이윤석, 2011).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사회생활의 출발점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방하남, 김기헌, 2001; 오호영,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청년 니트의 이행과정에서 가구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소득 수준, 종사상 지위 등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차승은, 2014; 황광훈, 2023). 그러나 집단주의적 신념과 교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더 높은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부모의 특성이나 배경만으로 가구 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 니트의 취업에 직접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인적자본이론(Schultz, 1962; Becker, 1964; 1975; Mincer, 1974)과 직업탐색이론(Hammermesh & Rees, 1987)에 따르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인적자본의 축적과 직업탐색 활동은 청년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여 구직대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과 직업탐색 활동을 이끌어 취업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구직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요소를 넘어, 청년의 인적자본 형성과 직업탐색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자원이라는 이론적 전제에 기반하여 분석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과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재발사건 생존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년기의 이행과정
생애발달 과정에서 청년기의 주요 특징은 ‘이행기(transition)’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 습득과 구직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취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Arnett, 2004; 이민서, 김사현, 2021). 1990년대 이전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단선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랐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행과정이 점차 길어지고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성이 증가했다(안선영 외, 2011; Ashton & Field, 1976; Banks et al., 1992; Bynner et al., 1997; Carter, 1962; Jones & Wallace, 1992). 이처럼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 장벽이 생겨나며 청년들이 점차 구직을 포기하거나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는 ‘니트(NEET)’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정준영, 2016).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틈새가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니트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김유선, 2017).
이러한 청년기의 과도기적 특징에 주목한 Arnett(2000)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발달 단계를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 지칭하며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도화된 산업사회이며 진학률 또한 매우 높으므로 청년기의 과도기적 특징을 고려한 이행과정의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기 이행과정에서 니트 현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Robson, 2008) 채창균 외(2015)는 적어도 니트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인 니트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니트의 탈출과 재진입을 되풀이하는 니트 상태 또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년 니트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니트 장기화의 심각성을 집중하여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이민서, 김사현, 2021; 박진원, 한창근, 2024) 실제 진행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또한 청년기의 단편적인 시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년 니트의 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청년 니트의 취업
본 연구에서 청년 니트의 개인 요인보다 가구 요인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현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종성, 이병훈, 2014; 이용호, 외 2021). 기존 연구들은 가구 요인 중 주로 가구 소득 수준이나 종사상 지위 등에 초점을 맞춰 청년 니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차승은, 2014; 황광훈, 2023).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다루어 청년기 이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Arnett(1998, 2004)에 따르면 청년기 이행과정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향해 발전해나가야 하는 단계이다. 이에 Arnett(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성인됨의 주요 지표로 삶에 대한 책임감, 독립적인 결정능력 그리고 경제적 자립 여부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년기의 이행과정에 관해 연구한 안선영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되는 기준을 Arnett(1998)의 연구결과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는 성인의 기준으로서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1). 즉, 우리나라 청년은 이행과정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미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Arnett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청년이 인식하는 성인의 기준과 발현 성인기 특징이 다른 원인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윤주영, 조민효, 2015). 개인주의 문화가 우세한 미국과 달리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로 발현 성인기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Arnett, 2011).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가족보호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신념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 의존 경향이 강하고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청년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수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특성이나 배경만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청년 니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청년에게 녹록하지 않은 현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 더욱 지연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이윤석, 2011; Buchmann & Solga, 2016). 선행연구를 보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하고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청년 직장 가입자는 10년 새 39.5%가 감소하였다(김선아, 2023). 즉,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와 2021년 각각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10여 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은 62.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데 2021년에 42.8%로 감소하였다. 반면,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8년 14.7%에서 2021년 21.7%까지 증가하여 이전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하였다(문무경 외, 2016; 박원순 외, 2021).
우리나라 청년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에는 첫째로 교육의 장기화 현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학진학률이 급증하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를 통해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다(방하남, 김기헌, 2001; 오호영, 2017). 게다가 많은 학생은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교육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취업을 위한 여러 학원에 다니거나 어학연수를 가고 있다(Roksa & Levey, 2010; 이윤석, 2011). 또한,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로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 전공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이윤석, 2011). 대학 등록금과 달리 학원 및 어학연수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비용 지출은 장학금 혜택 없이 모두 청년 개인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제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한 두 번째 이유는 오버 스펙(Over-spec) 현상으로 인해 취업 준비비용 부담 증가이다. 취업 준비생의 취업비용을 조사한 결과 한 달 기준 20만 원을 투자한다고 나타났으며 주거 및 생활비를 포함하면 약 8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도움을 통해 취업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나타났다(교육의 봄, 2024). 사실상 시간제 업종이나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더라도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이 길어진다면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은 구직과정 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 취업준비비용과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이윤석, 2011).
이처럼 자신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하려는 청년에게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관여함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훨씬 더 큰 사회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이제는 개인의 구직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난 것이다. 한때 공무원 시험이 선발시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청년들 사이에 열풍을 불었다. 그러나 김도영, 최율(2019)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합격확률조차 부모로부터 야기되는 계층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취업 전반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로부터 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청년은 구직과정의 시작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이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구직과정 내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음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청년 니트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검토가 중요하다(Manzoni, 2018).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이론
먼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Schultz(1962)와 Becker(1964) 등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는 교육, 훈련 등으로 획득한 개인이 지닌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 정보, 능력 즉 인적자본에 따라 결정된다(이대웅 외, 2015). 이러한 인적자본 수준은 인적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투자 자원인 원가구 소득 또는 부모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변금선, 2015).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하고 노동시장 내 성과를 이루어 높은 소득을 높이는 것이 부모의 유산을 물러주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한다(우광호 외, 2010). 특히 집단주의적 신념이 강한 우리나라는 자녀의 부와 성공을 곧 가족 전체의 부와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의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투자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Hammermesh와 Rees(1987)의 직업탐색이론 역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직업탐색이론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직업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직업탐색이 요구되며 직업탐색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Hammermesh & Rees, 1987).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가 직업탐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스러운 구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에 비례하는 직업탐색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배성숙, 장석인, 2014). 구직자는 직업탐색을 진행하는데 일종의 합리적 선택모형과 연속적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투자한 비용대비 효용이 높은 일자리를 발견할 때까지 지속적인 탐색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박지성, 옥지호, 2022). 따라서 만족스러운 구직의 결과와 구직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는 직업탐색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박지성, 옥지호, 2022). 이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인 직업탐색 활동을 이끌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선택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여준다(오성욱, 2017; Hammermesh & Rees, 1987).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연관된 두 이론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이론 모두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을 모델의 기본 축으로 상정하고 있다(김동준, 김양중. 2010). 오늘날과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기준은 높아지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스펙 또한 늘어나고 있다(방하남, 김기헌,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적자본의 축적과 직업탐색 활동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한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은 인적자본을 쌓거나 직업탐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격차를 경험하게 된다. 구직과정 내의 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등 청년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만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4차 년도(2010)부터 14차 년도(2020)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YP2007)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 활동, 가구 배경 등을 반영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고용정책의 수립과 청년고용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종단면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4차 년도부터 분석 자료로 사용한 이유는 청년 니트를 구분할 수 있는 경제활동 상태 문항에 대한 응답항목이 4차 년도 조사부터 구체화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청년 니트이며 OECD(2014)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으면서도 취업하지도 않는 만 18-34세인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직업훈련교육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거나2)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그리고 군입대 대기자는 제외한 집단을 청년 니트로 정의할 것이다. 청년패널조사(YP2007)의 4차 년도 조사에서 ‘지난 1개월 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구직활동, 취업준비(고시, 직업훈련 등), 진학준비(재수 등), 쉬었음, 18시간 미만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휴직이라고 응답한 청년 총 1,199명이며 14차 년도 조사까지 10년 동안 모두 응답을 한 청년은 741명이다. 무응답 및 기타 응답으로 인한 결측치가 있는 251명과 취업 또는 니트 상태가 아닌 상태(대학(원) 진학 등)로 인해 제외된 93명을 제외하여 총 39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때 연구 대상자 중 취업과 니트 상태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반복 케이스의 경우 개별 관측치로 간주하였다. 이에 기존 표본 측정값에 반복 케이스의 측정값을 추가함으로써 새롭게 패널 데이터 형식의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397명의 표본에서 총 602개의 관측치를 도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변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취업으로의 이행
청년 니트의 취업으로의 이행은 ‘4~14차 년도 취업 여부’와 ‘취업소요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행 확률(hazard ratio)을 계산하였다. 취업 여부는 4차 년도 조사시점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14차 년도 조사 시점인 2020년까지 누적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지난 조사 시점 이후 연구 대상인 청년 니트가 취업을 하였는지에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였다.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지난 1주간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자리)이나 일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질문의 응답에 따라 취업 여부를 구분하였으며 니트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0, 지난 조사 시점 이후 취업하였다면 1이다. 이때, 취업한 자의 기준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더라도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포함되었으며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도 취업자로 포함되었다. 취업 여부에 대해 0으로 입력된 응답자 중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조사 기간인 14차 년도(2020년)까지 관측하였을 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존 즉 취업하지 못한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제1형 우측중도절단(Type I censoring) 케이스도 존재한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으로 연구 대상자의 추적에 실패해서 관찰이 되지 않는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임의중도절단(random censoring)은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박재빈, 2007). 취업소요기간은 지난 조사 시점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전체 조사기간 중 취업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취업소요기간을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한 값을 활용하였고 총 120개월에 걸쳐 취업소요기간을 확인하였다.
나. 독립변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부모의 월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에서는 계층이나 집단별로 사건 발생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독립변수로 살펴보았다. 4차 년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문항의 응답에 따라 구분하고 ‘경제적 지원 有=0, 경제적 지원 無=1’으로 더미처리 하였다.
다음으로 Cox 비례헤저드 모형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을 경제적 지원 여부로만 측정했던 선행연구와 는 달리(Cobb-Clark & Gørgens, 2014; 윤주영, 조민효, 2015) 구체적인 지원 금액으로 분석하여 금액의 상대적인 편차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지원 금액은 4차 년도인 010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문항의 응답을 통해 월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을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및 월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을 4차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속적 지원’ 여부는 파악이 어려워 일시적으로라도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를 지원자로 간주하였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구직 시점에 청년의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탐색에 실질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Hammermesh & Rees, 1987; Becker, 1964), 지원의 '지속성'보다 '존재 여부'가 취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통제변수: 청년 니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변수는 청년 니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가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자아존중감이 포함되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니트 진입 위험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고(금재호 외, 2007; Genda, 2007; 김종성, 이병훈, 2014; 채창균 외, 2008), 연령은 20대 초반에 니트 비율이 높지만(채창균 외, 2008; 김종성, 이병훈, 2014) 연령 증가에 따라 니트 지속 경향도 나타났다(Genda, 2007; 김유선, 2017; 남재량, 2006; 차승은, 2014). 또한 국내에서는 고학력 청년일수록 니트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수도권 거주 청년이 비수도권에 비해 니트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17;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거주지역의 경우 니트의 진입과 탈출 가능성 모두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서울 지역 대비 다른 지역은 니트 상태에서 취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06). 자아존중감은 진로 발달과 구직 의지에 영향을 주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니트 상태를 지속할 위험을 높인다(노현주, 김윤태, 2019; Mendolia & Walker, 2015).
가구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부모의 종사상 지위, 주거환경, 주거 및 경제적 독립 여부가 있으며, 고소득 가구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고(Shinozaki, 2012), 저소득 가구 청년은 빈곤의 세습으로 니트화될 위험이 크다(나승호 외, 2013; Sadler et al., 201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노동시장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나승호 외, 2013; 이민서, 김사현, 2021), 주거환경이나 독립 여부 또한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박가열 외, 2008; 황광훈, 2023). 특히,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은 니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황광훈,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구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
3. 분석 방법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TATA 18.0을 사용하여 재발사건 생존분석(Recurring Events 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인 생존시간을 분석하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측정하는 통계 방법이다(박재빈, 2007). 생존분석에서는 양적 변화보다는 사망, 취업, 결혼 등과 같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장희원, 김경근, 2014). 생존분석을 사용하여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청년 니트의 취업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사용하기 위해 사건 발생을 청년 니트의 취업 여부로 그리고 생존시간을 청년 니트의 취업 소요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청년 니트의 취업에 대한 생존함수를 확인하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청년 니트의 취업 이행 속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Kaplan-Meier 생존함수는 표본이 t 직전까지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취업 확률을 보여준다. Kaplan-Meier 생존함수는 중도 절단 자료를 포함하여 각 연구 대상의 생존시간만 측정할 수 있다면 표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간단히 유도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계층이나 집단 별로 사건 발생 양상의 차이를 직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변수 하나의 요인 외의 다른 요인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요인에 따른 몇 가지 계층들의 차이만을 탐색적인 정도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생존분석 함수에 재발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공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험비를 확인할 수 있는 Cox 비례해저드모형(1972)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을 통해 청년 니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님 경제적 지원 금액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Cox 비례해저드모형은 생존시간인 종속변수가 위험함수 형태인 모형이다. 위험함수는 사건이 특정 시점 t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때 t 시점 바로 직후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h (t|X)는 시간 t에서 설명 변수 X 를 가진 집단의 위험함수, h0(t )는 기준 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 β는 설명변수의 계수백터를 의미한다. Cox 비례해저드모형은 로짓 모형과 같이 설명변수의 계수에 대하여 밑을 자연 상수로 하는 지수함수를 취함으로써 설명 변인의 차이에 따른 위험 비를 계산하여 설명변수가 취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보여준다. exp(0)=1이므로 설명변수의 위험비가 1보다 크면 설명변수 값이 증가할 때마다 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고 위험비가 1보다 작으면 설명변수 값이 증가할 때마다 취업 확률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Cox 비례해저드모형은 생존시간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중도 절단 자료를 포함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사용되고 있다(박재빈, 2007).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Cox 비례해저드모형이 기본적으로 설명변수와 사건 발생률 간 선형 관계를 전제하는 모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Klein & Moeschberger, 2003).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도, 인적자본이론(Schultz, 1962; Becker, 1964)과 직업탐색이론(Hammermesh & Rees, 1987)에 따르면 노동시장 성과는 투자 자원의 양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아, 경제적 지원과 취업 확률 간 선형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론적 타당성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취업 확률 간에 뚜렷한 비선형적 패턴이 관찰되지 않아, 분석의 해석 용이성과 모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형 가정을 채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 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고려하기 위해 재발사건 생존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발사건이란 한 명의 연구대상자가 2회 이상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종속변수가 기간 변수일 경우 사용되는 생존분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사건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반영된 분석 방법이다(Wei et al., 1989; Lin, 1994). 본 연구에서는 재발사건분석 방법 중 Andersen-Gill model(AG) 모델을 사용하였다. Andersen and Gill(1982)의 intensity 모델을 재발사건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확장형 모델이다. AG 모델은 첫 사건까지의 시간이나 두 번째 사건까지의 시간을 동일하게 처리하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순서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 계수 과정(counting process) 접근법을 사용하며 모든 사건의 생존 시간은 0에서 시작하지만, 직전 사건의 발생 시간까지를 지연된 가입 시간으로 간주한다. 즉, AG 모델은 개인의 반복된 사건을 발생하는 생존분석 자료에 맞는 모델로 각 발생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한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건은 독립적인 증가로 인식된다(Andersen & Gill, 1982). AG 모델의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여기서 λi(t )는 시간 t에서 개인 i의 사건 발생률, Yi(t)는 위험집단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Xi(t)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설명변수이다. 본 연구는 AG 모델을 통해 사건 순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사건을 독립적인 취업 이행 사례로 간주하였다. 다만, 동일 개인 내 반복 사건 간의 상관 가능성을 고려해 반복관측 간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분산 과소추정을 보정하는 추정방식인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가. 취업소요기간 및 취업발생 빈도
397명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총 601개의 취업 소요 기간 관측치를 구성하여 총 120개월간에 걸쳐 취업소요기간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전체 연구대상의 니트 수 126명, 취업자 수는 476명이며 총 누적 취업소요기간은 17128개월이며, 평균 3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 중 니트 상태를 유지한 수 68명, 취업자 수는 281명이며 총 누적 취업소요기간은 10045개월이며 평균 35.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중 니트 상태를 유지한 수는 58명, 취업자 수는 195명이며 총 누적 취업소요기간은 36.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보다 평균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취업소요기간
| 유형 | 니트 유지자 수 | 취업자 수 | 총 누적 취업소요기간(개월) | 평균(개월) |
|---|---|---|---|---|
| 경제적지원 有 (n=349) | 68 | 281 | 10045 | 35.7 |
| 경제적지원 無 (n=253) | 58 | 195 | 7083 | 36.3 |
| 전체 (n=602) | 126 | 476 | 17128 | 36.0 |
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표 2>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와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의 특성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는 18~26세(57.88%)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는 27~34세(56.13%)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는 비수도권 (55.00%)의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는 수도권(54.78%)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 및 학력과 자아존중감은 두 집단 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표
| 구분 | 변수 | 전체 (n=397) | 경제적 지원 有 (n=240) | 경제적 지원 無 (n=157) | ||
|---|---|---|---|---|---|---|
| 통제변수 | 개인요인 | 성별 | 여성 | 218명 (54.91%) | 129명 (53.75%) | 89명 (56.69%) |
| 남성 | 179명 (45.09%) | 111명 (46.25%) | 68명 (43.31%) | |||
| 연령 | 18~26세 | 313명 (51.99%) | 202명 (57.88%) | 111명 (46.87%) | ||
| 27~34세 | 289명 (48.01%) | 147명 (42.12%) | 142명 (56.13%) | |||
| 거주지역 | 수도권 | 194명 (48.87%) | 108명 (45.00%) | 86명 (54.78%) | ||
| 비수도권 | 203명 (51.13%) | 132명 (55.00%) | 71명 (45.22%) | |||
| 학력 | 고졸이하 | 102명 (25.69%) | 56명 (23.33%) | 46명 (29.30%) | ||
| 전문대졸 이상 | 295명 (74.31%) | 184명 (76.67%) | 111명 (70.70%) | |||
| 자아존중 | 평균 | 34.0점 | 34.1점 | 33.9점 | ||
| 가구요인 | 독립여부 | 동거 | 348명 (87.66%) | 220명 (97.67%) | 128명 (81.53%) | |
| 독립 | 49명 (12.34%) | 20명 (8.33%) | 29명 (18.47%) | |||
| 아버지 종사상지위 | 임금근로 | 173명 (43.58%) | 120명 (50.00%) | 53명 (33.75%) | ||
| 비임금 근로 | 158명 (39.80%) | 88명 (36.66%) | 70명 (44.58%) | |||
| 무직 | 66명 (16.62%) | 32명 (13.33%) | 34명 (21.65%) | |||
| 어머니 종사상지위 | 임금근로 | 94명 (23.68%) | 59명 (24.58%) | 35명 (22.29%) | ||
| 비임금근로 | 81명 (20.41%) | 50명 (20.83%) | 31명 (19.74%) | |||
| 무직 | 222명 (55.92%) | 131명 (54.58%) | 91명 (57.96%) | |||
| 취업한 가구원비율 | 평균 | 41.8% | 40.36% | 43.8% | ||
| 가구소득 | 평균 | 3560만원 | 3705만원 | 3338만원 | ||
| 입주형태 | 자가 | 309명 (77.83%) | 198명 (82.50%) | 111명 (70.70%) | ||
| 전월세 | 88명 (22.17%) | 42명 (17.50%) | 46명 (29.30%) | |||
| 주택종류 | 단독주택 | 104명 (26.20.%) | 64명 (26.67.%) | 40명 (25.48%) | ||
| 아파트 | 210명 (52.90%) | 125명 (52.08.%) | 85명 (54.14.%) | |||
|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 83명 (20.91%) | 51명 (21.25.%) | 32명 (20.38.%) |
가구 요인 중 독립여부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는 동거(97.67%)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버지 종사상 지위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는 임금근로(50.00%)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는 비임금근로(44.5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업한 가구원 비율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가 평균 43.8%로 더 높은 반면 가구소득은 평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가 평균 3705만 원으로 더 높았다. 어머니 종사상 지위와 입주형태 및 주택종류는 두 집단 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3>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에 따른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연구대상 전체인 397명의 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은 19.52만 원이었으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 금액은 32.29만 원이었다.
표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에 따른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표
| 구분 | 변수 | 평균(만원)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 전체 | 19.52 | 26.73 | 0 | 300 | |||
| 독립변수 | 부모의 경제적 지원 유무 | 경제적 지원 有 (n=240) | 32.29 | 27.74 | 3 | 300 | |
| 경제적 지원 無 (n=157) | 0 | 0 | 0 | 0 | |||
| 통제변수 | 개인요인 | 성별 | 여성 (n=218) | 19.77 | 22.50 | 0 | 150 |
| 남성 (n=179) | 19.31 | 29.81 | 0 | 300 | |||
| 연령 | 18~26세 (n=313) | 18.70 | 21.63 | 0 | 150 | ||
| 27~34세 (n=289) | 20.29 | 30.82 | 0 | 300 | |||
| 거주지역 | 수도권 (n=194) | 19.01 | 30.39 | 0 | 300 | ||
| 비수도권 (n=203) | 20.01 | 22.72 | 0 | 150 | |||
| 학력 | 고졸이하 (n=102) | 12.75 | 17.30 | 0 | 100 | ||
| 전문대졸 이상 (n=295) | 21.86 | 28.95 | 0 | 300 | |||
| 가구요인 | 독립여부 | 동거 (n=348) | 19.38 | 25.63 | 0 | 300 | |
| 독립 (n=49) | 20.48 | 33.81 | 0 | 150 | |||
| 아버지 종사상지위 | 임금근로 (n=269) | 21.76 | 24.16 | 0 | 150 | ||
| 비임금 근로 (n=226) | 16.68 | 19.42 | 0 | 100 | |||
| 무직 (n=107) | 20.42 | 43.17 | 0 | 300 | |||
| 어머니 종사상지위 | 임금근로 (n=158) | 21.65 | 30.71 | 0 | 150 | ||
| 비임금근로 (n=122) | 16.43 | 16.54 | 0 | 60 | |||
| 무직 (n=322) | 19.74 | 27.91 | 0 | 300 | |||
| 입주형태 | 자가 (n=309) | 19.56 | 21.48 | 0 | 150 | ||
| 전월세 (n=88) | 19.37 | 40.24 | 0 | 300 | |||
| 주택종류 | 단독주택 (n=104) | 18.94 | 23.35 | 0 | 150 | ||
| 아파트 (n=210) | 19.92 | 29.41 | 0 | 300 | |||
|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n=83) | 19.24 | 23.67 | 0 | 130 | |||
통제변수의 개인 요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이 더 높았다. 성별은 두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가구 요인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가 비임금근로보다 임금근로일 때 평균 금액이 더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직인 경우에도 비임금근로자보다 평균 경제적 지원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무직 집단에 은퇴로 인한 무직 상태인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평균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입주형태나 종택종류는 집단 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Kaplan-Meier 생존함수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생존 함수를 직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 Kaplan-Meier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Kaplan-Meier 추정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취업소요기간)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계산되며 사건이 관측(청년 니트의 취업) 된 시점마다 생존확률을 산출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소요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분석하였다. Kaplan-Meier 추정 그래프의 세로축은 생존 확률(니트 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취업소요기간(개월)을 의미한다.
전체 취업소요기간을 12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생존 함수(니트 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를 분석한 결과, 조사 종료시점인 120개월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 받는 청년 니트의 생존함수는 0.1948이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의 생존함수는 0.2292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청년 니트의 Kaplan-Meier 생존 함수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파란 실선)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빨간 실선)의 생존 함수를 통해 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반에는 두 곡선이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18개월을 기점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의 생존함수가 더 작아지면서 두 곡선 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이를 log-rank 검정으로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8개월 미만의 초기 구간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취업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조기에 진입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18개월 이후부터는 경제적 지원 집단의 생존곡선이 가파르게 하강하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취업 확률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구직 전략이나 훈련 참여가 가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 결과에 의한 단편적 해석보다는, 장기적 이행 경로에 주목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의 차이만을 탐색적인 정도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Kaplan-Meier의 한계를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년 니트의 취업으로의 이행 확률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Cox 비례해저드모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모형설계에 있어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 취업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및 가구요인을 동시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 중 최대 VIF 값 1.93). 전체 청년 니트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 금액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기준을 충족하며 위험비(Hazard ratio)가 1.002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금액의 위험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증가할수록 청년 니트 취업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원 금액이 1만원 증가할 때 취업 확률이 0.2% 가량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청년 니트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년 니트의 개인요인 중에는 성별(p<0.01)에서 위험비가 1.758로 나타나 남성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며 연령(p<0.01)에서 위험비가 0.804로 나타나 18~26세 집단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학력(p<0.01)에서 위험비가 1.531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 집단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청년 니트의 가구요인 중에는 아버지 종사상 지위(p<0.1)에서 위험비가 1.209로 나타나 아버지가 임금근로보다 무직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취업한 가구원 비율(p<0.05)에서 위험비가 1.006으로 나타나 가구원 내 취업한 가구원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입주 형태 중 전월세(p<0.1)에서 위험비가 1.190로 나타나 자가보다 전월세일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
성별 및 학력별 추가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주요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 금액의 긍정적 영향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세부 결과는 [부표 1, 2]에 제시하였다.
표 4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 (N=602) | |||||||||
|---|---|---|---|---|---|---|---|---|---|
| 변수 | Haz. ratio | Robust S. E. | z | ||||||
| 독립변수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 | 1.002 | 0.001 | 2.18** | |||||
| 통제변수 | 개인요인 | 성별 (기준: 여성) | 남성 | 1.758 | 0.137 | 7.24*** | |||
| 연령 (기준: 18~26세) | 27~34세 | 0.804 | 0.067 | -2.61*** | |||||
|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 비수도권 | 1.083 | 0.088 | 0.97 | |||||
| 학력 (기준: 고졸 이하) | 전문대졸 이상 | 1.531 | 0.145 | 4.49*** | |||||
| 자아존중감 | 0.998 | 0.010 | -0.17 | ||||||
| 가구요인 | 독립여부 (기준: 동거) | 독립 | 0.974 | 0.152 | -0.17 | ||||
| 아버지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1.064 | 0.097 | 0.68 | |||||
| 무직 | 1.209 | 0.132 | 1.74* | ||||||
| 어머니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0.965 | 0.108 | -0.32 | |||||
| 무직 | 1.084 | 0.109 | 0.80 | ||||||
| 취업한 가구원 비율 | 1.006 | 0.002 | 2.53** | ||||||
| 가구소득 | 1.022 | 0.015 | 1.50 | ||||||
| 입주형태 (기준: 자가) | 전월세 | 1.190 | 0.118 | 1.76* | |||||
| 주택종류 (기준: 단독주택) | 아파트 | 0.972 | 0.093 | -0.29 | |||||
|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 0.991 | 0.113 | -0.08 | ||||||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청년 니트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해나가야 할지 검토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2010년 기준 만 18~34세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취업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추가로 청년 니트 유형에 따라 취업 확률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여 첫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청년 니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른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에 따른 시각적 차이를 통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단기간(첫 조사시점 이후 12개월)으로 생존함수를 측정하였을 때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윤주영, 조민효, 2015).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취업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박진원, 한창근(2024)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에 재진입 했을 때 다시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 및 직업 탐색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빠른 시기 내에 떠밀려 나오듯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비숙련 일자리가 되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성은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된다(남재욱 외, 2018).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 중 경제적으로 지원 받지 않는 청년 니트가 취업과 니트 상태 반복을 경험한 비율이 경제적으로 지원 받는 청년보다 높았다.3) 반면, 전체 조사기간으로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를 보았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니트가 취업확률이 높은 것을 나타났으며 18개월을 기점으로 경제적 지원 받는 청년 니트의 취업속도는 이전보다 점차 빨라져 두 집단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취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청년 니트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년 니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행한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이 높아지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이 1만원 증가할 때마다 취업확률이 0.2% 증가한다. 이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고 현재 6개월 연속 하락세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통계청, 2024.10). 인적자본이론과 직업탐색이론을 기반 하여 부모의 경제적 여유 수준에서 나오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가 자신의 인적자본을 쌓고 직업탐색을 더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록 이후의 직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Manzoni(2018)의 연구와 ‘부모 다리’가 구직 과정에서 틈새시장으로 유도하는 메커니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Witteven & Attewell (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지원 여부가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에 실질적인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노동시장 초기 진입 과정에서도 재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탐색 기회 확대와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하여, 모든 청년이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년의 장기화된 이행과정을 고려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청년 니트의 취업 확률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종단연구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청년 니트를 일시적인 정체 상태로만 간주하거나 이행기의 반복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이민서, 김사현, 2021)를 지닌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다차년도 패널 자료와 재발사건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Arnett(2000)이 제시한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 개념과 니트 탈출 및 재진입을 반복하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반영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론(Schultz, 1962; Becker, 1964)과 직업탐색이론(Hammermesh & Rees, 1987)을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청년 니트의 취업에 미치는 가구 요인을 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종사상 지위(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차승은, 2014; 황광훈, 2023)로 측정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부모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탐색 활동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자원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부모의 사적소득 이전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Kim & Choi, 2011), 본 연구는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 취업 초기 단계부터 자녀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 지원이 미치는 계층적 효과에 대한 최근 논의(이지은, 정세은, 2019)와도 연결되며, 부모 경제적 지원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구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취업 확률에 실질적인 차이를 초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탐색 지원과 인적자본 축적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훈련비 지원, 구직활동 수당 제공 등 구직시장 내 실질적 취업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 초기 진입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진입 전인 고교 및 대학 단계에서 부터 청년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도움으로써 청년 니트의 증가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업 지원제도들은 가구 소득이나 부모 지원 여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구직의지만 있다면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부모 지원이 가능한 청년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족이 취업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한 구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청년 단체, 기업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대상 직업훈련, 취업 알선,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노동시장 초기 진입에서의 계층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핀란드의 'Ohjaamo(One-Stop Guidance Center)'는 정부기관과 청년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직업탐색, 상담, 교육훈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쇼핑몰 등 생활밀착형 장소에 센터를 설치하고, 개별 청년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로 진행하였고 10년의 장기간을 추적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조사 기간 내 모든 표본의 응답을 알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장기적인 변화 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AG 모형은 이러한 사건 간 종속성과 변화 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각 변수의 시간 변동의 비율을 확인하고 시간변동변수를 고려한 연구모형을 적용하면 시간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의 인적자본 축적이나 직업탐색 활동을 촉진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론적 경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패널 자료(YP 2007) 내에서도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참여 등 관련 변수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들은 응답률이 낮고 비응답 또는 결측이 많아, 분석 변수로 활용할 경우 표본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대표성 저하 및 통계적 왜곡 가능성이 있어 본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이론적 경로의 전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계로 작용하며, 향후 보완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쩨,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전인 2월 대비 4월에 청년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으며 청년 니트는 2월 대비 4월 105만 명 증가하였다(김유선, 2020). 코로나의 영향으로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전체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가져왔지만, 청년층이 겪은 피해 규모는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컸고 이후 고용 회복과정에서 소득 계층별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김유빈 외, 2022).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의 증가 폭이 작아지고 노동시장 이탈이 본격화되던 2020년이 본 연구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 이후 청년 니트의 취업 경로를 추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 니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Notes
OECD 정의가 정규 고등교육 중심의 제도화된 체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비공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에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비공식 훈련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청년 니트 규모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범식. 장윤희,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공식 교육 및 훈련 참여자는 니트에 제외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References
. (2024. 7. 3). 입사지원서 10개 스펙들에 대해 취준생이 인사담당자보다 2배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여,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bomedu2020/223500899773
, , .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https://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1201578512239
. (2024). [정책제안] 한국의 니트(NEET) 청년 실태 및 과제. 월간 공공정책, 220, 50-5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706146
. (2023. 12. 11). 청년가장 4명 줄 때 노인가장 11명 늘어. 동아경제. https://www.daenews.co.kr/23637
, , , , . (2022). 코로나 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https://dl.kli.re.kr/index.jsp/10110/contents/6019814
, , , . (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3-15].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47/view.do?nttId=195430&menuNo=200432
. (2006).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 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140-157. https://www.kli.re.kr/board.es?mid=a40606000000&bid=0029&tag=&act=view&list_no=101739
, , .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797
, , . (2008). 대졸청년층 취업가능성 지수개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1761
, , . (2021).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Ⅴ).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086
, .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01147
, . (2019). 2019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청년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177-192.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10721
. (2016).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월간 복지동향 [207], 15-2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94040
, , , , . (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2&pstNo=E120141207
, , , . (2015).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2&pstNo=G520150007-2
. (2024. 10.).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PubMed]
(2007). Jobless youths and the NEET problem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0(1), 23-40. https://www.jstor.org/stable/30209681
(1994). Cox regression analysis of multivariate failure time data: the marginal approach. Statistics in Medicine, 13(21), 2233-2247. [PubMed]
(2018). Parental Support and Youth Occupational Attainment: Help or Hindr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8), 1580-1594. [PubMed]
부록
부표 1.
성별에 따른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 (N=602) | |||||||||
|---|---|---|---|---|---|---|---|---|---|
| 변수 | 여성 (n=360) | 남성 (n=242) | |||||||
| Haz. ratio | Robust S. E. | z | Haz. ratio | Robust S. E. | z | ||||
| 독립 변수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 | 1.001 | 0.000 | 1.53 | 1.003 | 0.002 | 1.42 | ||
| 개인요인 | 연령 (기준: 18~26세) | 27~34세 | 0.660 | 0.080 | -3.38*** | 1.092 | 0.152 | 0.64 | |
|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 비수도권 | 1.062 | 0.110 | 0.59 | 1.068 | 0.152 | 0.46 | ||
| 학력 (기준: 고졸 이하) | 전문대졸 이상 | 1.320 | 0.154 | 2.38** | 1.568 | 0.231 | 3.05*** | ||
| 자아존중감 | 0.950 | 0.126 | -0.39 | 0.925 | 0.146 | -0.49 | |||
| 가구요인 | 독립여부 (기준: 동거) | 독립 | 0.915 | 0.201 | -0.40 | 1.074 | 0.242 | 0.32 | |
| 아버지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1.002 | 0.113 | 0.02 | 1.300 | 0.195 | 1.74* | ||
| 무직 | 1.289 | 0.184 | 1.78* | 1.095 | 0.186 | 0.53 | |||
| 어머니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0.920 | 0.126 | -0.60 | 0.998 | 0.193 | -0.01 | ||
| 무직 | 0.928 | 0.111 | -0.63 | 1.521 | 0.288 | 2.21** | |||
| 취업한 가구원 비율 | 1.003 | 0.003 | 1.06 | 1.010 | 0.003 | 3.09*** | |||
| 가구소득 | 1.004 | 0.018 | 0.26 | 1.054 | 0.025 | 2.22** | |||
| 입주형태 (기준: 자가) | 전월세 | 1.143 | 1.140 | 1.09 | 1.666 | 0.268 | 3.17*** | ||
| 주택종류 (기준: 단독주택) | 아파트 | 1/058 | 0.137 | 0.44 | 0.920 | -.136 | -0.56 | ||
|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 1.077 | 0.169 | 0.48 | 0.766 | 0.141 | -1.44 | |||
| *p<0.1, **p<0.05, ***p<0.01. | Wald chi(15)=36.94 Prob>chi2=0.0013 Log likelihood=-1406.5081 |
Wald chi(15)=45.06 Prob>chi2=0.0001 Log likelihood=-1005.4131 |
|||||||
부표 2.
학력에 따른 Cox 비례해저드모형 분석
| (N=602) | |||||||||
|---|---|---|---|---|---|---|---|---|---|
| 변수 | 고졸 이하 (n=169) | 전문대졸 이상 (n=433) | |||||||
| Haz. ratio | Robust S. E. | z | Haz. ratio | Robust S. E. | z | ||||
| 독립 변수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금액 | 1.000 | 0.005 | 0.04 | 1.002 | 0.001 | 2.47** | ||
| 통제 변수 | 개인요인 | 성별 (기준: 여성) | 남성 | 1.359 | 0.199 | 2.10** | 1.986 | 0.194 | 7.02*** |
| 연령 (기준: 18~26세) | 27~34세 | 0.738 | 0.140 | -1.59 | 0.782 | 0.078 | -2.45** | ||
|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 비수도권 | 1.097 | 0.175 | 0.58 | 1.092 | 0.105 | 0.91 | ||
| 자아존중감 | 0.850 | 0.154 | -0.89 | 1.067 | 0.122 | 0.57 | |||
| 가구요인 | 독립여부 (기준: 동거) | 독립 | 1.153 | 0.294 | 0.56 | 0.860 | 0.181 | -0.71 | |
| 아버지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0.995 | 0.208 | -0.02 | 1.128 | -.114 | 1.19 | ||
| 무직 | 1.197 | 0.269 | 0.80 | 1.246 | 0.160 | 1.71* | |||
| 어머니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1.066 | 0.231 | 0.30 | 0.924 | 0.120 | -0.60 | ||
| 무직 | 1.253 | 0.244 | 1.16 | 1.014 | 0.126 | 0.11 | |||
| 취업한 가구원 비율 | 1.003 | 0.004 | 0.72 | 1.006 | 0.002 | 2.36** | |||
| 가구소득 | 1.043 | 0.029 | 1.51 | 1.007 | 0.018 | 0.41 | |||
| 입주형태 (기준: 자가) | 전월세 | 1.294 | 0.207 | 1.55 | 1.167 | 0.147 | 1.23 | ||
| 주택종류 (기준: 단독주택) | 아파트 | 0.869 | 0.178 | -0.68 | 1.035 | 0.116 | 0.31 | ||
|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 1.105 | 0.250 | 0.44 | 0.905 | 0.132 | -0.67 | |||
| *p<0.1, **p<0.05, ***p<0.01. | Wald chi(15)=21.28 Prob>chi2=0.1281 Log likelihood=-553.13018 |
Wald chi(15)=71.75 Prob>chi2=0.0000 Log likelihood=-1921.2779 |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1-29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5-0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6-16

- 901Download
- 5149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