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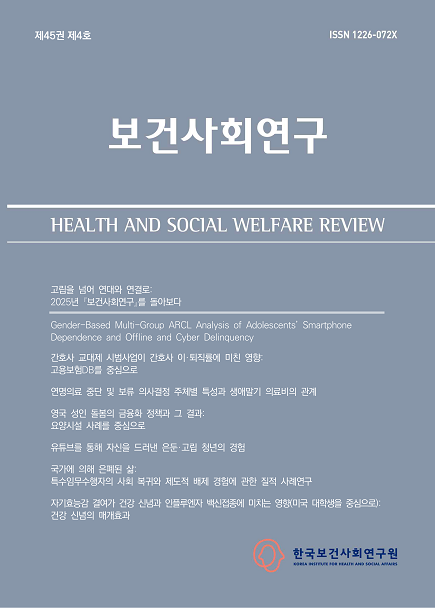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Park, Byung-Sun; Bae, Sung-Woo*; Park, Kyoung-Jin; Seo, Mi-Kyung; Kim, Hye-ji
보건사회연구, Vol.37, No.2, pp.72-101, June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72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analyze data on a total of 2,231 3rd-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ile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was not direct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Second, peer attachment and social withdrawal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peer attachment directly influenced social withdrawal. Thir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was confirmed b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social depression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ed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i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order to enhance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the peer attachment and redu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전체자료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231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우울이며, 사회적 위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이지영, 2008),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Berndt & Keefe, 1995; Davies & Kandel, 1981).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학교는 심리적 독립이라는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차적 장소이며,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라, 박분희, 2017).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5~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치로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여성가족부, 2015)과 같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 또래관계 혹은 또래애착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실제로 학교생활에서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수정,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의 애착보다 또래와의 애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전효성, 이귀옥, 2002; 조은정, 2008). 그러므로 이 시기에 또래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사회적 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주요한 생활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김문선, 2013; 김민수, 2013; 김현주, 홍상황, 2015; 모정은, 2011; 문은식, 2012a, 2015b; 박은민, 2010;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이수하, 2005;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이지영, 2008;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정택용, 2015; 지수경, 2001; Armsden & Greenberg, 1987). 더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의 애착을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높을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심수정, 2003; 이경아, 정현희, 1999). 반대로 청소년기에 또래에 대한 애착을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최경일, 2012; Dalley, Bolocofsky, Alcorn & Baker, 1992). 특히, 또래애착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 우울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으며(문수정, 2016),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박미려, 양은주, 2017),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위험행동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우혜림, 2015). 이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들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 가운데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울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의 대표적인 변인으로서 또래애착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문수정, 2016),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아영, 이명희, 200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은민, 2010;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안윤정, 현진희, 2015; 우수경, 김기예, 2013; 이서원, 2012; 이혜순, 옥지원, 2012). 그리고 우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주목하여야 할 변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친구들과 함께 있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등 학교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 타인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교사나 급우들과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2016).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박기원, 2014; 정일영, 2016; Rubin, Coplan & Bowker, 2009).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또래 거부, 외로움, 우울 증상, 부정적인 자기존중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김보영, 장은비, 2015; 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 Boivin, Hymel, & Bukowski, 1995;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나타나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이 여러 변인 중 하나로 다루어질 뿐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과 우울 및 학교생활적 응이라는 변인이 유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의 모든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어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서 교사 및 또래 등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칙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다(이상훈, 2005; 조성희, 김희수, 2016; 주현정, 1998).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업적・사회적・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김영춘, 2014; 문은식, 2015)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한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정적・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김분, 최연실, 2012; 김희수, 2004; 박은민, 2010). Bowlby(1983) 에 의하면 애착의 형성과 유지, 붕괴와 재개에서 강력한 정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한다(우혜림, 2015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는 대신 부모로부터 독립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부모에 대한 관심은 점차 또래로 이동하게 되고,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은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민수, 2013).
이러한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 실제로 생활하는 것보다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옥정, 1998;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7; Berndt & Keefe, 1995). 실제로 또래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문은식, 2012;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다른 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문선, 2013; 김민수, 2013; 김현주, 홍상황, 2015; 문은식, 2015; 지수경, 2001). 즉,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며,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생활에서도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우경, 2013; Berndt, 198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위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문제는 개인의 기질적인 것이 아닌 또래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다(민원홍, 손선옥, 2017; Coie & Koeppl, 1990).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될 경우, 수줍음, 행동의 억제, 고립과 거절, 사회적 침묵(social reticence), 소극성과 또래 무시(neglect) 등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Coplan & Bowker, 2009). 또한,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이해, 우울, 불안과 관련이 높아 대인관계, 행동문제 등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교사나 급우들과 적극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정일영, 2016),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서도 취약할 수 있다(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박기원, 2014; 정일영, 2016; Rubin, Coplan & Bowker, 2009).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으로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업성취, 학습활동참여, 학교출석,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등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향후 성인기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김금순, 김은미, 2015; 박기원, 2014).
3.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까지 광범위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정서이다(김성일, 정용철, 2001). Beck(1974)은 우울 증상으로 슬프고 무감각한 감정, 자기비난이나 무가치감 등의 부정적 자아개념, 다른 사람이나 일들로부터 도피, 수면장애와 식욕부진, 성욕상실 그리고 활동수준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재인용).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우울 증상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을 보이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 자체가 감소되어 있으며(이희정, 2010),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죄책감, 자기비하, 창피함, 과다수면, 체중변화 등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신재은, 1999). 즉, 우울로 인하여 활동이 감소되거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 내재적인 문제 및 반항적인 행동 등과 같은 외재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경험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우울을 경험하는 많은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집중력 하락으로 학업성적과 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강승희, 2010). 입시중심의 경쟁적이고 타율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이명희, 2008). 또한, 우울이 청소년의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에 부적응을 초래하고(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학교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9).
우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환경, 학교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은민, 2010;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안윤정, 현진희, 2015; 우수경, 김기예,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수행능력,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정희, 2008; 이혜선, 2002). 또한, 청소년들은 우울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우울이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등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명식, 2009; 유지애, 2016; 이미지, 2014; 최경일, 2012).
4.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과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종합적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보영, 장은비, 2015;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실제로도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과 함께(Rubin & Barstead, 2014)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보영, 장은비, 2015; 김혜영, 2013; 문수정, 2016; 박은민, 2010; 우혜림, 2015;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이미현, 2014; 조미희, 2013)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 및 불안증상, 사회적 미성숙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 2005). 이러한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분노, 낮은 자존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 학업중단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Rubin, Coplan & Bowker, 2009).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 혹은 우울의 내면적 문제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되거나(김현순, 2008) 불안장애, 물질의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옥정, 1998).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Boivin, Hymel & Bukowski, 1995),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우유라, 노충래, 2014)이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 우울과 같은 내면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 Boivin, Hymel & Bukowski, 1995; Rubin & Mills, 1988). 또한 사회적 위축은 분노, 낮은 자존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과 상관있을 뿐 아니라 낮은 학업성취, 학업중단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이러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과의 연관성은 아동(Strauss, Forehand, Smith & Frame, 1986), 청소년(Vargo, 1996), 젊은 성인(Alfano, Joiner & Perry, 1994)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에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351명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추출(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거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년도 조사결과에서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2,351명에 대한 3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포함된 120명을 제외한 2,23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총 문항은 20문항이고 주요 하위요인으로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의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과 같은 학교규칙,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과 같은 교우관계,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등과 같은 학습활동,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등과 같은 교사관계이다. 각 문항의 응답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이며, 4점 척도로 합산한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별 합산점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1584.055(p<.001), RMSEA=.062, NFI=.893, IFI=.903, CFI=.902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는 전체 .86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학교규칙 .788, 교우관계 .537, 학습활동 .745, 교사관계 .841이다.
나.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김지연(1995)이 번안하고 수정한 애착척도(IPPA)를 황미경(2010)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전체가 9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 의사소통 2문항, 신뢰 4문항, 소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이다. 신뢰는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이다. 소외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이다.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소외 3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이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별 합산점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또래관계의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또래애착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χ2=281.762(p<0.001), RMSEA=.069, NFI=.970, IFI=.973, CFI=.973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는 .79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사소통 .824, 신뢰 .789, 소외 .768이다.
다. 우울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에서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이며,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하위요인으로 우울A(신체화 증상)는 우울1(기운이 별로 없다), 우울2(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우울3(걱정이 많다), 우울4(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이다. 우울B(우울 감정)는 우울5(울기를 잘 한다), 우울6(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우울7(외롭다)이다. 우울C(부정감정)는 우울8(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우울9(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울10(모든 일이 힘들다)이다. 10문항을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우울을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χ2=392.637(p<0.001), RMSEA=.071, NFI=.966, IFI=.968, CFI=.968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6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5개 문항을 사용하고 측정하고 있다.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위축1(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사회적 위축2(부끄럼을 많이 탄다), 사회적 위축3(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회적 위축4(수줍어한다), 사회적 위축5(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이다. 각 문항의 응답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이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다. 하위요인 5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사회적 위축의 잠재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사회적 위축을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χ2=220.603(p<0.001), RMSEA=.139, NFI=.963, IFI=.963, CFI=.963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83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배병렬, 2014).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AMOS에서는 다중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분석에 있어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Bootstrapping 추정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별 매개변수의 유의성이 아닌 전체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별 매개효과의 개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각 경로의 매개효과를 단일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배병렬, 2014).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포함한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최대우도추정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적합도는 RMSEA, NFI, IFI, CFI를 통해 확인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1,126명(50.5%), 여자가 1,105명(49.5%)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으로 2,231명(100%)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분포는 대도시가 873명(39.2%), 중소도시가 1,031명(46.2%), 읍/면 지역이 327명(14.6%)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231)
| 특성 | 구분 | 사례 수(명) | 비율(%) |
|---|---|---|---|
| 성별 | 남자 | 1,126 | 50.5 |
| 여자 | 1,105 | 49.5 | |
| 학년 | 중학교 3학년 | 2,231 | 100 |
| 거주지역 | 대도시 | 873 | 39.2 |
| 중소도시 | 1,031 | 46.2 | |
| 읍/면 지역 | 327 | 14.6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사용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으며, 주요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이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 변수명 | 평균(M) | 표준편차(SD) | 왜도 | 첨도 |
|---|---|---|---|---|
| 또래애착 | 2.29 | .45 | .037 | .612 |
| 사회적 위축 | 2.74 | .74 | .029 | -.547 |
| 우울 | 3.02 | .62 | -.226 | -.323 |
| 학교생활적응 | 2.21 | .39 | -.054 | .667 |
표 3
주요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 의사소통합 | 1 | ||||||||||||||
| 신뢰합 | .758** | 1 | |||||||||||||
| 소외합 | .145** | .184** | 1 | ||||||||||||
| 학습활동합 | .268** | .240** | .131** | 1 | |||||||||||
| 학교규칙합 | .177** | .149** | .057** | .496** | 1 | ||||||||||
| 교우관계합 | .413** | .400** | .194** | .420** | .384** | 1 | |||||||||
| 교사관계합 | .278** | .255** | .007 | .401** | .391** | .377** | 1 | ||||||||
| 우울A | -.252** | -.249** | -.300** | -.184** | -.099** | -.232** | -.126** | 1 | |||||||
| 우울B | -.159** | -.160** | -.258** | -.178** | -.122** | -.189** | -.074** | .661** | 1 | ||||||
| 우울C | -.244** | -.251** | -.327** | -.247** | -.147** | -.276** | -.153** | .661** | .734** | 1 | |||||
| 사회적 위축1 | -.256** | -.215** | -.207** | -.115** | -.053* | -.250** | -.130** | .507** | .387** | .406** | 1 | ||||
| 사회적 위축2 | -.168** | -.130** | -.093** | -.097** | -.020 | -.166** | -.114** | .458** | .336** | .354** | .579** | 1 | |||
| 사회적 위축3 | -.282** | -.233** | -.206** | -.163** | -.051* | -.272** | -.133** | .529** | .401** | .414** | .608** | .615** | 1 | ||
| 사회적 위축4 | -.161** | -.109** | -.126** | -.086** | -.019 | -.193** | -.092** | .476** | .378** | .389** | .547** | .756** | .630** | 1 | |
| 사회적 위축5 | -.241** | -.203** | -.115** | -.146** | -.058** | -.235** | -.178** | .510** | .302** | .363** | .526** | .589** | .611** | .562** | 1 |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나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 잠재변수 | 비표준화계수(B) | 표준화계수(β) | C.R | |
|---|---|---|---|---|
| 또래애 | 의사소통 | 1.000 | .890 | - |
| 신뢰 | .996 | .850 | 29.422*** | |
| 소외 | .305 | .199 | 8.771*** | |
| 우울 | 우울A | 1.000 | .808 | - |
| 우울B | .977 | .830 | 41.571*** | |
| 우울C | 1.350 | .848 | 42.351*** | |
| 사회적 위축 | 사회적 위축1 | 1.000 | .723 | - |
| 사회적 위축2 | 1.150 | .824 | 37.008*** | |
| 사회적 위축3 | 1.054 | .790 | 35.543*** | |
| 사회적 위축4 | 1.185 | .829 | 37.218*** | |
| 사회적 위축5 | 1.006 | .718 | 32.324*** | |
| 학교 생활적응 | 학습활동 | 1.000 | - | - |
| 학교규칙 | .907 | .690 | 22.777*** | |
| 교우관계 | .706 | .622 | 23.717*** | |
| 교사관계 | 1.005 | .663 | 21.866*** | |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최대우도법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이 χ2=1407.711(df=84), p<.001, RMSEA=.084, NFI=.909, IFI=.914, CFI=.914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 X2 (df) | p-value | RMSEA | NFI | IFI | CFI | ΔX2 (df) | |
|---|---|---|---|---|---|---|---|
| 초기모형 | 1407.711(84) | .000 | .084 | .909 | .914 | .914 | .025(1) |
| 수정모형 | 1407.736(85) | .000 | .084 | .909 | .914 | .914 | p=.873 |
연구모형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를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한 결과, 사회적 위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형을 위해 이 경로를 삭제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한 후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모형과 χ2 값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5. 최종모형의 분석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2],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χ2=1407.736(df=85), p<.001, RMSEA=.084, NFI=.909, IFI=.914, CFI=.914로 나타나 모형 전체의 적합도 수준이 양호하였다. 최종모형의 개별 경로에 대한 확인을 위한 모수치 추정 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최종모형의 요인들 간 경로계수
| 경로 | 비표준화계수(B) | 표준화계수(β) | 표준오차(S.E.) | C.R. |
|---|---|---|---|---|
| 또래애착 → 우울 | -.178 | -.145 | .026 | -6.727*** |
| 또래애착 → 사회적 위축 | -.129 | -.286 | .011 | -11.569*** |
| 또래애착 → 학교생활적응 | .599 | .435 | .037 | 15.039*** |
| 사회적 위축 → 우울 | 1.578 | .581 | .070 | 22.646*** |
| 우울 → 학교생활적응 | -.205 | -.195 | .035 | -7.299*** |
최종모형의 요인들 간 경로계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우울(β=-.145, p<.001)과 사회적 위축(β=-.286, p<.001), 학교생활적응(β=.43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적 위축은 우울(β =.581, p<.001)에, 우울은 학교생활적응(β=-.19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ing 검증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있다.
표 9
최종모형의 전체 매개효과(비표준화 회귀계수)
| 경로 | 총효과 | 직접효과 | 매개효과 | 간접신뢰구간 |
|---|---|---|---|---|
| 또래애착 → 학교생활적응 | .637 | .495 | .078 | .060~.100* |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개별적인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애착 → 우울 →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애착 → 사회적 위축 → 우울 →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팬텀변수를 포함한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비표준화계수)
| 경로 | 추정치(B) | 표준오차(S.E.) | 간접신뢰구간 |
|---|---|---|---|
| 또래애착 → 우울 → 학교생활적응 | .036 | .008 | .023~.050* |
| 또래애착 → 사회적 위축 → 우울 → 학교생활적응 | .042 | .007 | .031~.053**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애착 → 우울 →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 매개효과는 .036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신뢰구간에서 .023~.050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래애착 → 사회적 위축 → 우울 →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는 .031~.05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3차년도 데이터 중 2,231명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우울이었으며, 사회적 위축의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문선, 2013; 김현주, 홍상황, 2015; 문은식, 2012a, 2015b;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와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정민, 송수지, 2014; 최경일, 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낮은 학업성취, 학교회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박기원, 201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 자녀 가구의 증가 및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활동에 익숙해질 뿐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의 양적・질적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고 있는 척도의 경우 약 20여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최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대면적인 관계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의 개념이 사회의 변화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인 현상만으로 사회적 위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선행연구(김아영, 이명희, 2008; 박애규, 2009;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와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구본미, 2015; 박기원, 2014), 사회적 위축은 우울의 예측요인(김보영, 장은비, 2015; 허인영, 2016; Boivin, Hymel & Bukowski, 1995;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이라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며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이서원, 2012; 이응택, 주현주, 유난영, 2013; 이희정, 2010)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박기원, 2014)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낮으면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우울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우울로 연결되어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실천의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래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가 제도 또는 선・후배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또한, 학교 내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된 청소년이 있을 경우, 학교사회복지사나 학교 내・외의 전문상담사 등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 및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구의 교육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개발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학교별 우수 프로그램 및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멘토링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관련 학교와 지역의 대학생들을 연계한 멘토링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한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래애착을 높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위축이나 우울의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개선을 위하여 다학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밀착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식・비공식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직접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인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등의 변수는 성별 혹은 학교급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비교를 통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높게 만드는 요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PubMed]
, &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PubMed]
, &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16-924. [PubMed]
, , , & (1986).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4), 525-53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4-24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6-15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6-23

- 17223Download
- 455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