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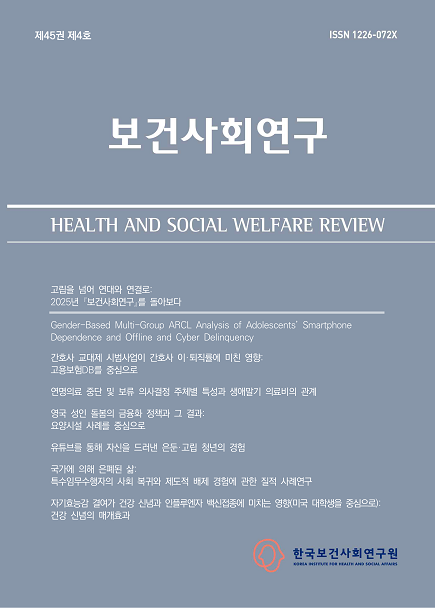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A Longitudinal Study on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Old People: Using a Panel Logit Model
Lee, Sangwoo
보건사회연구, Vol.37, No.3, pp.191-229, Sept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3.19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poor and non-poor older people.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2015) and conducted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ver time in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public assistance, economic activity, annual income,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ly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poor older people. Depression, self-esteem, gender, age, household type were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Third, on the other hand, annual income was the only economic factor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And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hronic disease,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physical health and marital status. Suicide ideation of poor older people, however,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such as poverty, job status, income and home ownership.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verified predictors on suicide ideation irrespective of pover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 (2012년)~10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노인의 자살생각경험에 대하여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일반노인은 연간 소득액,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만성질환 있음, 연령, 배우자 있음, 단독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에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신체적 요인,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Ⅰ. 서론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삶은 행복한가? 물론 과거와 비교할 때 노인의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5년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은 54.9세로 세계 기대수명 51.1세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15년 현재에는 81.4세로 세계 기대수명 70.5세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UN, 2015). 이는 대표적인 장수국가로 구분되는 일본(2015년 83.3세)과 이탈리아(2015년 82.8세) 등과 함께 한국 역시 세계적인 장수국가 반열에 올라왔음을 보여주는 실태라 할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곧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기대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61세가 되던 해를 환갑(環甲)이라 하여 집안의 큰 경사로 축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기준이 크게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은 평균 71.7세로 65세보다 약 6세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p.220). 그러나 서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과연 늘어난 수명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 역시 비례하여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붙는다. 다양한 사회적 지표와 통계현황은 대개 그렇지 않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2017) 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0대 25.1명, 40대 29.9명인 것에 반해서 60대 36.9명, 70대 62.5명, 80대 이상 83.7명으로 고연령대 노인집단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한국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떤 한 사람이 1년 중 단 한 번의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삶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살론의 저자로 저명한 사회학자인 Durkheim(2006, p.19)은 “자살은 스스로를 희생시키며 수행되는 행위로부터 기인한 죽음의 형태로써, 자살의 행위자는 그것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자살의 원인에는 개인이 가진 정신병적 특성이나 기후 및 기온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특성 이외에도,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자살과 관련하여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수치나 현상들은 자살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관련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있다(Baudelot & Establet, 2008, p.8). 가령 여성의 자살이 남성의 자살보다 낮다는 통계적 수치는, 자살에 있어서 여성이 왜 남성에 비해 덜 취약한가, 자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노인의 빈곤은 자살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앞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고연령대 노인집단의 높은 자살률과 비례하여 보고되는 것이 노인빈곤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약 3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OECD, 2015a, p.56),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약 0.50) 역시 2013년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한다(OECD, 2017). 외국의 선행연구들 역시 노인의 자살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Coren & Hewitt, 1999, p.112; Whitley, Gunnell, Dorling & Smith, 1999, p.1034; Shah, Bhat, Mackenzie & Koen, 2008, p.347). 이들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살률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 빈곤의 문제는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과 함께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중 하나로써,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망감 또는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학진, 2011, p.653; 신학진 2012, p.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노인의 빈곤에 따른 자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 자료에 의존하여 노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형태, 2002; 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김현순, 김병석, 2007; 엄태완, 2007). 횡단면에서의 회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변수 간 정적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요인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해 통계적 유의성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 종단자료에 비해 고려할 수 있는 정보 및 변수들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강상진, 1998, p.210; 민인식, 최필선, 2012, pp.2-3). 물론 연구자료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매개 및 조절효과 등의 검증을 통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일 활용 가능한 종단자료가 제공된다면, 종단분석을 통해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 관련 현황과 실천적・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빈곤을 포함한 전체 노인집단의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을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자살 예방정책의 대상특성별 개입전략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년도(2012년)부터 10차 년도(2015년)까지의 4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패널 로짓(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노인의 자살개념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앞서 Durkheim이 정의한 자살의 개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살이란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자살에 대한 생각을 통해 자살시도 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살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위기상태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미 자살을 주제로 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Beck, Kovacs & Weissman, 1979; Coren & Hewitt, 1999; Lee, Hahm & Park, 2013; Shin et al., 2013; 엄태완, 2007; 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김명화, 김홍수, 2011)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변수라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살의 개념 및 관련 현황
가.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의 개념
전통적인 자살의 개념은 앞서 서론에서 Durkheim의 정의와 같이 스스로를 희생시킴으로써 발생한 죽음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Rosenberg 외(1988, p.1446)는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자신을 해함으로써 발생한 죽음”으로 정의하였고, De Leo, Burgis, Bertolote, Kerkhof, Bille-Brahe(2004, p.36)는 “자살은 죽음을 초래하는 행동으로써 자신을 위협하는 자기주도의 수동적/능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죽음이라는 목적 또는 기대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때 자살은 ‘자신이 원하는 변화’ 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살이라는 개념 안에 행위자의 ‘의도’ 또는 ‘목적’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념구분이 시도되고 있다(Klonsky, May & Saffer., 2016, p.309). 설사 어떤 행동의 결과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가 죽는 것이었다면 자살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DSM-5에서는 죽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살행동장애(suicidal behavior disorder)와 그렇지 않은 행동(nonsuicidal self-injury; NSSI)으로 구분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두 개념 간에는 빈도(NSSI가 보다 자주 발생), 방법(NSSI에 비해 자살이 더 치명적 방법 선택), 기능(NSSI의 경우 죽으려는 의도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일시적 완화를 위해)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자살의 개념 및 정의와 관련한 논의가 심층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접근과 개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앞서 자살의 개념을 자살행동장애와 비자살적 가해(NSSI)로 구분한 것은 죽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행위의 상대적 중요성을 떨어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살생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살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미 수행된 자살(completed suicide)을 예측할 수 있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을 계획하거나 고민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Klonsky, May & Glenn, 2016, pp.320-3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사회복지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살행위가 이미 발생한 이후 시점의 완료된 자살시도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자살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노인자살 관련 현황
자살에 대한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사례가 일관된 경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미국의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3.26명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크게 낮고, 연령대별 자살률 역시 45~64세 장년집단이 인구 10만명당 19.6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이 19.4명, 35~44세 중년집단 이 17.1명, 65~84세 집단이 1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17). 미국의 경우 전체 연령별 집단 중 자살에 있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집단은 45~64세 집단과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집단인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캐나다(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1.3명) 역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는 집단은 중장년에 해당되는 55~59세(17.6명), 45~49세(17.5명), 50~54세(17.1명) 집단이었다. 반면 65~69세는 10.5명, 75~79세 9.3명, 85~89세 11.1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Statistics Canada, 2017). 1950년부터 1998년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영국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Gunnell, Middleton, Whitley, Dorling & Frankel(2003, p.596)의 연구에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갖는 반면 20~40대 젊은 연령집단의 자살률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국가들의 연령별 자살률 현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자살률 특성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년층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2015년 기준 80대 이상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83.7명에 이르는 수준이다(중앙자살예방 센터, 2017). 이는 한국 사회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와는 구별되는 한국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는 사회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인의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
가.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노인의 자살에 대한 영향요인은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O’Connell, Chin, Cunningham & Lawlor, 2004, pp.896-898). 노인의 자살에는 다양한 예측변수들이 있으며, 먼저 심리적 요인에는 스스로 인지하는 우울증상이 자살의 강력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Bruce 등(2004, p.1081)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자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울수준에 주목하고,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빈곤과 함께 자살의 유의미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우울수준을 연구모형에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증상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불안장애, 정신병적 장애, 약물오남용 등도 자살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nwell, Duberstein & Caine, 2002, p.193). 다음으로 신체적 요인에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수준이 중요한 설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가령 노년기에 발병하기 쉬운 다발성 경화증, 소화성 궤양, 신장질환, 척수외상 등의 신체적 장애와 질병은 노인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clough, 1971; O’Connell 외 재인용, 2004, p.897). 또한 중한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자살위험은 연소노인(65~74세)보다 고령노인(75세 이상)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Waern, Rubenowitz & Wilhelmson, 2002, p.332). 마지막 사회적 요인에는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 지지와 고립, 외로움 등이 자살위험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Rubenowitz, Waern, Wilhelmson & Allebeck, 2001, p.1198). 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할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Vanderhorst & McLaren, 2005, p.517). 이는 노인이 은퇴,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하였을 때,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사별 등으로 인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 적절한 사회적지지 자원이 감소하여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다. 즉 자살문제에 있어서 혼인상태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에 비해 연령이 젊은 남성노인집단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겪게 되는 자살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O’Connell, Chin, Cunningham & Lawlor, 2004, p.898). 선행연구들을 통해 최근 한국 사회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예: 독거노인 증가)가 사회적 지지 자원의 부족과 자살생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종교성과 삶의 만족수준 역시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Clain, Rosenfel & Breitbart, 2003, pp.1605-1606).
한편 노인의 자살생각 및 문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 역시 외국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우울증상이 검증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수들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김형태, 2002; 김현순, 김병석, 2007; 고재욱, 김수봉, 2011; 김명화, 김홍수, 2011; 최령, 황병덕, 2014).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노인이 스스로 인식한 경제적 수준, 실제 소득수준 등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로 상반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변수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특정 지역에 제한된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라는 점,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단순히 주관적 경제상태 및 소득수준 변수만을 분석모형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예: 노인의 빈곤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 가령,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여부,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여부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 노인의 빈곤과 자살
‘빈곤’은 과거 구빈법 제정(1601), 베버리지 보고서(1942) 등과 같이 사회보장의 역사가 태동할 때부터 이미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해결하기로 합의된 전통적 의미의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빈곤문제 역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왔다. 특히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빈곤한 노인’의 출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면 심각성이 더욱 크다. OECD(2015b, p.171)의 보고에 따르면, 횡단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호주의 33.5%보다 16% 가량 높고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2.0%보다 약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4%, 미국이 21.5% 수준이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 12.4%보다도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노인빈곤의 종단적 추이 역시 외국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외국의 노인빈곤율이 시간 변화에 따라 점점 감소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럽 EU 27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1)은 19.0%~20.0%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아일랜드(2004년 40.0% → 2008년 21.0%), 그리스(2004년 28.0% → 2008년 22.0%), 포르투갈 (2004년 29.0%→ 2008년 22.0%) 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aidi, 2010, p.21). 미국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5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노인의 빈곤율은 1959년 35.0% 수준에서 2014년 현재 10.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21.1%로 노인집 단에 비해 높았다(DeNavas-Walt, Proctor & Smith, 2015, p.14). 반면 외국과 다르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06년 52.9%, 2010년 55.1%, 2014년 56.0%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은희, 이주미, 2015, p.84). 노인의 빈곤문제가 시간이 지날수 록 심화되는 현상은 외국의 사례와는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노령연금이 수급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고, 기초연금 등 노인을 위한 보편적 차원의 공적 소득보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 등 경제적 상태와 자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Durkheim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적 변수들을 규명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좌절-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공격적 감정이 자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상태의 개선은 좌절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Henry & Short, 1954). Harwood, Hope, Harriss, Jacoby(2006, pp.1268-1270)의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실제로 자살을 통해 죽은 60세 이상 노인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자살을 통해 죽은 집단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은 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비자살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살집단의 죽음은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질병 외에도 은퇴 및 경제적 어려움(부채, 소득감소)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 등 경제적 요인은 연소노인(young old) 집단의 자살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홍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중국노인 917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Yip, Chi, Chiu, Wai, Conwell, Caine(2003, p.1056)의 분석결과에서도,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함께 경제적 상태가 자살생각의 중요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제적 상태 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정부에 의한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은 상황에서 노인의 빈곤문제가 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노인자살의 문제를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숙향과 황경란(2016, p.263)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 중 하나로써 경제적 배제(소득수준)와 함께 문화적 배제 및 사회참여적 배제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할 수는 없었다. 노인의 사중고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신학진, 2011, p.653)에서는, 노인의 빈곤문 제가 나머지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의 어려움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 국 역시 노년기 빈곤문제가 노인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 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의 분석대상이 특정 지역의 경로당 이용노인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 횡단면 조사를 통해 다양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의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순아와 이상록(2016, p.296)의 연구에서는 음식과 필수재, 주거와 의료 영역 등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결핍수준과 노인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물질적 결핍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의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전 해숙(2016, p.225)의 연구 역시 국내 80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 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조 수급노인들의 자살위험 속도가 비수급노인의 자살위 험 속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빈곤노인의 자살을 감소하는데 있어 나름의 유의미한 개입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 나 공공부조와 자살위험의 인과적 관계에 있어서 다른 외생적 요인들(예: 공공 사회서비 스 이용경험, 민간의 사회적지지 자원, 신체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 수준 등)을 통합적으 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애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더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정준수, 이혜경, 2016, p.55). 이처럼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연구모형 에 공공부조 수급, 물질적 결핍 등의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노인의 빈곤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노인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보여주고, 각 집단별 세부적인 영향요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연구모형 상에서 빈곤여부를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각 조사시점 연도와 조사응답자의 출생연도를 계산하여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년도(2012년)부터 10차년도(2015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의 기간은 분석을 위한 사례 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7차년도에 신규 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자살생각에 대한 질문 내용은 6차년도(2011년) 조사 때부터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7차년도 조사 때부터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범주가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년도~10차년도까지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로써, 농어가와 읍면지역까지도 표본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을 전체 표본의 약 50% 정도 할당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연구나 빈곤 연구에 적합한 패널조사라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2. 변수 측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경험은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1)’ 또는 ‘아니오(0)’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2015년 동안의 각 패널 조사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살생각은 구체적인 자살계획 및 시도에 의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위기상태라 할 수 있다(O’Connell, Chin, Cunningham & Lawlo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근거 도출을 위해 자살생각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고 65세 이상 노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심리적 요인에는 노인의 자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우울수준을 투입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우울은 4점 리커트 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의 1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CES-D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3점으로 다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4점 리커트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 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의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만족수준은 응답자의 건강,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일,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요인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성질환 여부, 장애정도를 투입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은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은 조사기간(2012~2015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인해 투병・투약한 경험이 있는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였다. 장애정도는 ‘0=비해당’, ‘1=경증’, ‘2=중증’, ‘3=비등 록장애인’으로 범주화했다.
인구사회적 요인에는 2012~2015년 동안 조사에 응답한 노인이 이용한 사회적 서비스 자원(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배달, 방문 가정간호,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보호,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의 양을 투입하였다. 최소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0개부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본 11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0=남성, 1=여성), 연령(만 나이), 교육수준(0=무학, 1=중졸 이하, 2=고졸 이하, 3=대졸 이상), 혼인상태(0=무배우자, 1=유배우자), 종교(0=없음, 1=있음), 가구형태(0=비단독가구, 1=단독가구)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 중 빈곤문제를 포함하는 경제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관적 경제상태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공부조 수급여부(0=비수급, 1=수급), 공적연금 수급여부(0=비수급, 1=수급), 조사일 기준 경제활동 참여상태(0=미취업, 1=임금근로자, 2=자영업, 3=무급가족종사자), 연간 소득액,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0=비자가, 1=자가) 등으로 투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빈곤노인과 일반노인으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빈곤노인(1), 그렇지 않으면 일반노인(0)으로 구분하였다. 투입되는 변수들의 측정과 연구의 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경제적 특성(공공부조 수급여부,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 심리적 특성(우울 등), 신체적 특성(만성질환 여부 등),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형태 등)에 따라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교차분석)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의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logit)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요인 중 빈곤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는 빈곤노인의 특성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빈곤노인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빈곤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노인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패널 로짓 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때 추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2, p.238).
는 관찰되지 않는(latent) 실제 종속변수이고 yjt 는 의 관찰값(observed value) 이다. 여기서 yjt = 1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위 식에서 F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로써, 로짓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 n)2)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종속변수 에 대해 패널개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 uj를 포함한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오차항의 동분산성 가정을 위배하거나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문영만, 2013, pp.140-141).
uj 는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을 갖지만 하나의 패널개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ejt 는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패널 로짓모형에서는 오차항 uj 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지는데, uj 를 확률효과로 간주할 경우 uj ∼ N (o, )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ejt 는 로지스틱 분포로 가정하고 최우추정법을 이용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pp.238-239). 본 연구에서는 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추정하였으며, 승산비(odds ratio)를 함께 계산하여 독립변수(xk)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승산(자살생각 경험)이 전 승산에 비해 몇 배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38~39%, 여성은 60~61% 수준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012년 74.32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41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매 조사년도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3~2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1~13%, 대학교 졸업 이상이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경과에 따라 무학 비율은 감소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2012년 유배우자 집단은 60.15%에서 2015년 58.76%까지 감소한 반면, 무배우자 집단은 2012년 39.27%에서 2015년에는 41.24%로 증가하였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단독가구 비율은 26.70%에서 2013년 27.41%, 2014년 28.10%, 2015년 28.84%로 증가하였다. 종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012년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비율은 60.73%에서 2015년 57.23%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단위: 명, %) |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
| 사례 수(n) | 5307 | 5231 | 5156 | 5128 | |
| 성별 | 남성 | 2100(39.57) | 2049(39.17) | 1996(38.71) | 1967(38.36) |
| 여성 | 3207(60.43) | 3182(60.83) | 3160(61.29) | 3161(61.64) | |
| 연령(평균, SD) | 74.32(6.27) | 74.72(6.32) | 75.04(6.43) | 75.41(6.51) | |
| 교육수준 | 무학 | 1450(27.32) | 1371(26.21) | 1279(24.81) | 1210(23.60) |
| 중졸 이하 | 2922(55.06) | 2927(55.95) | 2929(56.81) | 2932(57.18) | |
| 고졸 이하 | 632(11.91) | 640(12.23) | 653(12.66) | 688(13.42) | |
| 대졸 이상 | 303(5.71) | 293(5.60) | 295(5.72) | 298(5.81) | |
| 혼인상태 | 유배우자 | 3192(60.15) | 3132(59.87) | 3072(59.58) | 3013(58.76) |
| 무배우자 | 2115(39.85) | 2099(40.13) | 2084(40.42) | 2115(41.24) | |
| 가구형태 | 가구원동거 | 3890(73.30) | 3797(72.59) | 3707(71.90) | 3649(71.16) |
| 단독가구 | 1417(26.70) | 1434(27.41) | 1449(28.10) | 1479(28.84) | |
| 종교 | 있음 | 3223(60.73) | 3161(60.43) | 3047(59.10) | 2935(57.23) |
| 없음 | 2084(39.27) | 2070(39.57) | 2109(40.90) | 2193(42.77) | |
| 만성질환 | 있음 | 4662(87.85) | 4678(89.43) | 4649(90.17) | 4534(88.42) |
| 없음 | 645(12.15) | 553(10.57) | 507(9.83) | 594(11.58) | |
| 장애정도 | 비해당 | 4361(82.17) | 4283(81.88) | 4230(82.04) | 4202(81.94) |
| 경증 | 716(13.49) | 747(14.28) | 740(14.35) | 741(14.45) | |
| 중증 | 158(2.98) | 144(2.75) | 138(2.68) | 138(2.69) | |
| 비등록 | 72(1.36) | 57(1.09) | 48(0.93) | 47(0.92) | |
| 연간 소득수준(만원) | 2116.6 | 2219.7 | 2182.1 | 2290.1 | |
| 빈곤여부 | 일반 | 2058(38.78) | 1945(37.18) | 1888(36.62) | 1942(37.87) |
| 저소득 | 3249(61.22) | 3286(62.82) | 3268(63.38) | 3186(62.13) | |
| 국기초 | 수급 | 589(11.10) | 577(11.03) | 562(10.90) | 552(10.76) |
| 비수급 | 4718(88.90) | 4654(88.97) | 4594(89.10) | 4576(89.24) | |
| 공적연금 | 수급 | 1546(30.30) | 1603(31.86) | 1610(32.32) | 1669(33.82) |
| 비수급 | 3556(69.70) | 3428(68.14) | 3371(67.68) | 3266(66.18) | |
| 주거형태 | 자가 | 3541(66.72) | 3488(66.68) | 3461(67.13) | 3453(67.34) |
| 비자가 | 1766(33.28) | 1743(33.32) | 1695(32.87) | 1675(32.66)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미취업 | 3283(64.36) | 3233(64.26) | 3213(64.51) | 3259(66.04) |
| 임금근로 | 515(10.10) | 544(10.81) | 566(11.36) | 534(10.82) | |
| 자영업 | 944(18.51) | 910(18.09) | 872(17.51) | 823(16.68) | |
| 무급가족종사자 | 359(7.04) | 344(6.84) | 330(6.63) | 319(6.46) | |
다음으로 응답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여부, 장애정도 실태를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의 경우 모든 조사년도에서 87~90% 가량의 응답자들이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정도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18~20% 가량이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장애정도가 경증인 응답자는 13~14% 내외였고,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등록 장애의 비율은 1%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일반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이는 시간경과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저소득 노인집단의 비율은 61.22%에서 2014년 63.38%, 2015년 62.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의 연간 소득수준은 연간 2100~2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조사응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은 10~11% 내외로 나타났다. 즉 65세 이상의 조 사응답자 10명 중 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중위소득 60% 기준 저소득 대상자 기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율은 2012년 11.1%에서 2015년 10.76%로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증가하였으나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은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실태라 할 수 있겠다. 노인의 또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0~33%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중 조사기간 동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점유가 66~67%, 비자가점유의 형태가 32~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약 2/3수준으로 나타났고, 시간경과에 따라 미취업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자영업 비율이 16~18%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자살생각 경험 및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시간경과에 따라 자살생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4.84%에서 2013년 5.04%, 2014년에는 6.1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3.74%로 감소하였다.3) 우울의 경우 CES-D 척도를 활용하여 우울증 위험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전체 응답자 중 30% 미만의 노인들이 우울증위험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집단에 포함되는 노인의 비율은 2012~2015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2012년 22.09%에서 2014년 29.17% 수준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 23.56%로 조금 감소하였다. 연구대상 전체 노인의 우울척도 평균점수 역시 2012년 9.51점, 2013년 9.76점, 2014년에 11.12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 9.43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4년 동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수준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먼저 자아존중감 평균은 2.8점 수준에서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수준 역시 3.2~3.3점의 범위 내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그저 그렇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 및 심리적 특성
| (단위: %, 점) |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자살생각 경험(있음)4) | 4.84 | 5.04 | 6.12 | 3.74 | |
| 우울5) | 정상군 | 77.91 | 75.83 | 70.83 | 76.44 |
| 고위험군 | 22.09 | 24.17 | 29.17 | 23.56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전체 평균(SD) | 9.51(9.22) | 9.76(9.84) | 11.12(9.93) | 9.43(9.85) | |
| 자아존중감 평균(SD) | 2.83(0.40) | 2.85(0.42) | 2.83(0.41) | 2.86(0.38) | |
| 삶의 만족 평균(SD) | 3.21(0.48) | 3.27(0.50) | 3.21(0.49) | 3.33(0.49) | |
2. 분석대상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율 차이
<표 3>은 분석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H0 :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를 전체, 일반노인 및 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자살생각 경험 비율 차이
| (단위: %) | |||||||
|---|---|---|---|---|---|---|---|
| 구분 | 전체 | 비빈곤노인 | 빈곤노인 | ||||
|
|
|
|
|||||
| 비율 | χ 2 | 비율 | χ 2 | 비율 | χ 2 | ||
|
|
|||||||
| 성별 | 남성 | 4.31 | 9.71** | 2.21 | 7.21** | 5.99 | 0.51 |
| 여성 | 5.34 | 3.29 | 6.34 | ||||
| 연령 | 65~69세 | 5.00 | 2.38 | 3.29 | 3.10 | 7.16 | 9.56** |
| 70~79세 | 5.10 | 2.56 | 6.47 | ||||
| 80세 이상 | 4.48 | 2.47 | 5.13 | ||||
| 혼인상태 | 유배우자 | 3.93 | 57.93*** | 2.63 | 1.54 | 4.95 | 34.62*** |
| 무배우자 | 6.42 | 3.18 | 7.62 | ||||
| 가구형태 | 가구원동거 | 3.84 | 112.59*** | 2.59 | 7.72** | 4.93 | 49.13*** |
| 단독가구 | 7.58 | 4.30 | 6.22 | ||||
| 종교 | 있음 | 4.62 | 6.24* | 2.70 | 0.38 | 5.82 | 4.48* |
| 없음 | 5.44 | 2.95 | 6.79 | ||||
| 만성질환 | 있음 | 5.25 | 28.33*** | 3.08 | 12.21*** | 6.47 | 11.75** |
| 없음 | 2.52 | 1.06 | 3.82 | ||||
| 빈곤여부 | 일반 | 2.79 | 106.18*** | - | - | - | - |
| 빈곤 | 6.22 | - | |||||
| 국기초 | 수급 | 12.14 | 246.39*** | - | - | - | - |
| 비수급 | 4.06 | - | - | ||||
| 공적연금 | 수급 | 3.64 | 31.52*** | 2.55 | 1.21 | 4.85 | 12.12*** |
| 비수급 | 5.57 | 3.00 | 6.67 | ||||
| 주거형태 | 자가 | 3.36 | 196.61*** | 2.39 | 17.77*** | 4.16 | 115.34*** |
| 비자가 | 8.15 | 4.57 | 9.09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미취업 | 6.08 | 95.08*** | 3.47 | 15.18** | 7.36 | 63.41*** |
| 임금근로 | 3.74 | 2.15 | 5.43 | ||||
| 자영업 | 2.33 | 1.72 | 2.78 | ||||
| 무급가족종사자 | 3.08 | 1.97 | 3.85 | ||||
| 우울 | 정상군 | 1.59 | 1.3*** | 1.28 | 308.70*** | 1.82 | 854.02*** |
| 고위험군 | 14.96 | 10.97 | 16.17 | ||||
먼저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의 차이에서는 전체의 경우 여성(5.34%)이 남성 (4.31%)에 비해 자살생각이 조금 더 높았다. 일반노인에서도 여성(3.29%)이 남성(2.21%)에 비해 더 높았으나, 빈곤노인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대체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빈곤노인의 경우에만 65~69세의 연소노인(7.16%)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79세(6.47%), 80세 이상(5.1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서는 일반노인을 제외한 전체노인과 빈곤노인에서 모두 무배우자 노인이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전체노인에서 단독가구(7.58%)가 가구원동거(3.84%)의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크게 높았다. 일반노인과 빈곤노인에서 역시 단독가구, 즉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간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전체노인과 빈곤노인에서 종교가 있는 노인의 자살생각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전체노인에서는 만성질환이 있음(5.25%)이 없음(2.52%)에 비해 더 높았고, 일반노인 역시 만성질환 있음(3.08%)이 만성질환 없음(1.06%)에 비해 높았다. 빈곤노인에서도 만성질환 있음(6.47%)이 없음 (3.82%)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빈곤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노인(2.79%)에 비해 빈곤노인(6.22%)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을 비교해본 결과 역시, 수급하는 경우 (12.14%)와 그렇지 않은 경우(4.06%) 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노인에서는 공적연금 수급(3.64%)이 비수급(5.57%)에 비해 자살생각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일반 노인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빈곤노인에서는 수급(4.85%)과 비수급(6.67%) 간 차이가 나타났다. 주거형태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자가와 비자가 간 자살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빈곤노인의 경우 비자가(9.09%)의 경우 자가(4.16%)에 비해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취업의 자살생각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금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주거형태가 불안정하며, 현재 일자리가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의 우울수준을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상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울 고위험군의 자살생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에서 고위험군의 자살생각 비율은 14.96%로 정상군의 1.59%에 비해 크게 높았고, 빈곤노인 역시 고위험군의 자살생각 비율은 16.17%로 정상군 (1.82%)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우울 위험이 있는 노인들이 자살생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 검증
가.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 검증
본 연구의 65세 이상 전체 분석대상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LR검정(likelihood-ratio test, H0 : 확률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분석결과는 χ2=37.05(p<.001)으로 패널 개체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합동 로짓(pooled logit)보다 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2; 문영만, 2013). Wald Chi2 검정(H0 :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0)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975.19, p<.001).
표 4
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6)
| 구분 | Coefficient | S.E. | Z | Odds Ratio | |
|---|---|---|---|---|---|
| 경제적 요인 | |||||
| 공공부조 수급(0=비수급, 1=수급) | 0.268* | 0.127 | 2.11 | 1.308* | |
| 공적연금 수급(0=비수급, 1=수급) | -0.111 | 0.110 | -1.00 | 0.894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기준: 미취업=0) | 임금근로 | -0.181 | 0.157 | -1.15 | 0.834 |
| 자영업 | -0.481** | 0.150 | -3.19 | 0.617** | |
| 무급가족종사자 | 0.114 | 0.209 | 0.55 | 1.121 | |
| 연간 소득액(만원) | -0.051 | 0.113 | -0.46 | 0.949 | |
| 집의 점유형태(0=비자가, 1=자가) | -0.361*** | 0.099 | -3.64 | 0.696*** | |
| 빈곤여부(0=일반, 1=빈곤) | 0.034 | 0.153 | 0.23 | 1.035 | |
| 심리적 요인 | |||||
| 우울 | 0.096*** | 0.004 | 21.14 | 1.100*** | |
| 자아존중감 | -0.914*** | 0.125 | -7.27 | 0.400*** | |
| 삶의 만족 | -0.263** | 0.100 | -2.62 | 0.768*** | |
| 신체적 요인 | |||||
| 주관적 건강(1~5점) | 0.045 | 0.057 | 0.78 | 1.046 | |
| 만성질환 여부(0=없음, 1=있음) | 0.330 | 0.182 | 1.81 | 1.391 | |
| 장애정도 (기준: 비해당=0) | 경증 | -0.195 | 0.122 | -1.60 | 0.822 |
| 중증 | -0.551 | 0.283 | -1.95 | 0.575 | |
| 비등록 | -1.615* | 0.799 | -2.02 | 0.198* | |
| 인구사회적 요인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0~11개) | 0.027 | 0.039 | 0.69 | 1.027 | |
| 성별(0=남성, 1=여성) | -0.387** | 0.116 | -3.34 | 0.678** | |
| 연령 | -0.069*** | 0.008 | -8.00 | 0.932*** | |
| 교육수준 (기준: 무학=0) | 중졸 이하 | 0.013 | 0.107 | 0.13 | 1.014 |
| 고졸 이하 | 0.149 | 0.175 | 0.85 | 1.161 | |
| 대졸 이상 | 0.206 | 0.247 | 0.83 | 1.229 | |
| 혼인상태(0=무배우자, 1=유배우자) | 0.407** | 0.155 | 2.62 | 1.503** | |
| 종교(0=없음, 1=있음) | -0.016 | 0.087 | -0.19 | 0.983 | |
| 가구형태(0=비단독가구, 1=단독가구) | 0.600*** | 0.169 | 3.55 | 1.822*** | |
| 상수 | 3.622** | 1.242 | 2.91 | 37.427** | |
| Wald Chi2 | 975.19*** | ||||
| LR-test(χ2) | 37.05*** | ||||
| 패널 개인 수 | 5519 | ||||
| 전체 관측 사례 수 | 17731 | ||||
먼저 경제적 요인 중 공공부조 수급여부, 경제활동 참여상태, 집의 점유형태 등이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의 경우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수급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이 1.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p<.05).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자영업을 하는 노인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경험이 0.67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 에서는 자신의 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 경험이 0.69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공적연금 수급여부 및 빈곤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의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분석대상 노인의 우울수준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 경험은 높아졌다(odds ratio: 1.308, p<.001). 반면 자아존중감 수준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 경험은 낮아지고(odds ratio: 0.400, p<.001), 삶의 만족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odds ratio: 0.768, p<.001). 이는 노인의 자살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검증된 우울 등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와 같은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Bruce et al., 2004; O’Connell, Chin, Cunningham & Lawlor, 2004).
신체적 요인 관련 변수들 중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비장애인 집단이 비등록 장애인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다 (p<.05). 그러나 분석대상 중 비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해 비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교육수준, 종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살생각 위험이 0.67배 낮았고(p<.01),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은 0.93배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횡단면 자료에서 고연령대 집단의 자살률이 높다는 일반적 현황의 맥락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연령과 자살생각 경험 간의 부적 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O’Connell et al., 2004; 정준수, 이혜경, 2016)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동일한 대상을 연속적으로 측정한 종단자료라는 점, 그리고 70대 중후반의 노인들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노화과정을 수용하고 심리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정준수, 이혜경, 2016, p.57).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자살생 각의 위험이 1.5배 정도 높았고(p<.01), 가구형태는 동거가구원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1.82배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p<.001). 또한 가구 내에 동거하는 가구원의 여부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고립과 외로움 등 문제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Rubenowitz, Waern, Wilhelmson & Allebeck, 2001).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오히려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영규, 2009; 이묘숙, 2012)와 다른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 등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부담이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최신애, 하규수, 2012, pp.273-275).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빈곤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노인을 중위소득 60%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노인과 빈곤노 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살생각 경험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표 5). LR검정 (H0 : 확률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결과, 2개의 분석모델 모두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하우스만 검정7)을 실행한 결과 두 모델(비빈곤노인, 빈곤노인) 모두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1보다 크게 나와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민인식, 최필선, 2012, p.246).
표 5
일반노인과 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비교(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
| 구분 | 비빈곤노인 | 빈곤노인 | |||
|---|---|---|---|---|---|
|
|
|
||||
| Coefficient | Odds Ratio | Coefficient | Odds Ratio | ||
|
|
|||||
| 경제적 요인 | |||||
| 공공부조 수급(0=비수급, 1=수급) | 0.536 | 1.709 | 0.291* | 1.338* | |
| 공적연금 수급(0=비수급, 1=수급) | 0.258 | 1.295 | -0.218 | 0.803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기준: 미취업=0) | 임금근로 | -0.447 | 0.639 | -0.083 | 0.919 |
| 자영업 | -0.507 | 0.601 | -0.474** | 0.622** | |
| 무급가족종사자 | -0.410 | 0.663 | 0.390 | 1.478 | |
| 연간 소득액(만원) | 0.426* | 1.531* | -0.223† | 0.799† | |
| 집의 점유형태(0=비자가, 1=자가) | -0.314 | 0.730 | -0.392** | 0.675** | |
| 심리적 요인 | |||||
| 우울 | 0.094*** | 1.099*** | 0.099*** | 1.104*** | |
| 자아존중감 | -1.203*** | 0.300*** | -0.850*** | 0.427*** | |
| 삶의 만족 | -0.544* | 0.580* | -0.167 | 0.845 | |
| 신체적 요인 | |||||
| 주관적 건강 | 0.153 | 1.166 | 0.005 | 1.005 | |
| 만성질환 여부(0=없음, 1=있음) | 1.039* | 2.828* | 0.144 | 1.155 | |
| 장애정도 (기준: 비해당=0) | 경증 | -0.454 | 0.634 | -0.115 | 0.890 |
| 중증 | -1.096 | 0.334 | -0.427 | 0.652 | |
| 비등록 | -1.518 | 0.219 | -1.628 | 0.196 | |
| 인구사회적 요인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0~11개) | 0.143 | 1.154 | -0.003 | 0.996 | |
| 성별(0=남성, 1=여성) | 0.071 | 1.074 | -0.530*** | 0.588*** | |
| 연령 | -0.066** | 0.935** | -0.071*** | 0.931*** | |
| 교육수준 (기준: 무학=0) | 중졸 이하 | 0.509 | 1.663 | -0.052 | 0.948 |
| 고졸 이하 | 0.380 | 1.462 | 0.276 | 1.318 | |
| 대졸 이상 | 0.764 | 2.148 | 0.057 | 1.058 | |
| 혼인상태(0=무배우자, 1=유배우자) | 0.701* | 2.016* | 0.290 | 1.336 | |
| 종교(0=없음, 1=있음) | -0.154 | 0.857 | 0.011 | 1.011 | |
| 가구형태(0=비단독가구, 1=단독가구) | 1.166** | 3.209** | 0.432* | 1.541* | |
| 상수 | -1.019 | 0.360 | 5.016*** | 150.88*** | |
| Wald Chi2 | 189.28*** | 679.61*** | |||
| LR-test(χ2) | 8.14** | 30.98*** | |||
| 패널 개인 수 | 2,822 | 4,056 | |||
| 전체 관측 사례 수 | 6,511 | 11,220 | |||
먼저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노인 집단에서는 연간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odds ratio: 1.531, p<.05). 그러나 이 같은 분석결과만으로 단순히 소득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빈곤하지 않은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소득과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상태와의 관계를 정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빈곤노인 집단에서는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 등 일반노인에 비해 다양한 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약 1.3배(p<.05) 높았고, 자영업 중인 노인이 미취업 상태의 노인에 비해 0.6배 자살생각 경험이 낮았다(p<.01). 또한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가 자신의 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6배 더 자살생각 경험이 낮았다(p<.01). 연간 소득액의 경우 일반노인과 반대로 소득액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낮아졌다(odds ratio: 0.799, p<.1). 이러한 결과는 일반노인에 비해 빈곤노인의 정신건강이 경제적 상태와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년기 경제적 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다. 노인빈곤의 문제가 노년기 자살생각 위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노인의 경우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모두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빈곤노인에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인의 우울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odds ratio: 1.099, p<.001). 또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살생각은 각각 0.3배(p<.001), 0.5배(p<.05) 감소하였다. 빈곤노인의 경우 우울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 경험은 높아졌고(odds ratio: 1.104. p<.001), 자아존중감이 한 단위 증가하면 자살 생각은 감소하였다(odds ratio: 0.427, p<.001). 다음 신체적 요인 중에서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로는, 오직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2.8배 더 높게 나타났다(p<.05). 빈곤노인의 경우 신체 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인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노인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의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고, 빈곤노인은 연령, 가구형태와 함께 추가적으로 성별이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반노인의 경우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낮았고(odds ratio: 0.935, p<.01),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2.0배 자살생각이 높았으며(p<.05), 노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가구구성원과 함께 사는 비단독가구에 비해 3.2배 더 자살생각이 높았다(p<.01). 반면 빈곤노인의 경우에는 성별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 빈곤노인이 남성 빈곤노인에 비해 약 0.5배 더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낮았다(p<.001). 연령은 일반노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고(odds ratio: 0.931, p<.001), 가구형태 역시 단독가구가 비단독가구에 비해 1.5배 자살생각이 높았다(p<.05). 한편 일반노인과 빈곤노인 집단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교육수준, 종교의 유의미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에 관한 일반노인과 빈곤노인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빈곤노인의 경우 특히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을 수 있는 노인의 빈곤문제와 자살문제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빈곤노인 집단에 비해 추가적으로 만성질환 등 신체적 요인, 혼인 상태 등과 같은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서 노인빈곤이라는 한국의 사회문제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년도(2012년)부터 10차년도(2015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고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약 5% 수준 내외로 나타났다. 둘째,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빈곤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6.22%)이 일반노인(2.79%)에 비해 높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12.14%)이 비수급자(4.06%)에 비해 높았고, 주거 점유형태가 비자가(8.15%)인 경우가 자가(3.36%)인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6.08%)의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노인의 빈곤과 자살 문제 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실태라 할 수 있겠다. 셋째, 65세 전체 분석대상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패널 로짓 분석 결과, 공공부조 수급노인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이 자영업을 하는 노인에 비해, 주거 점유형태가 비자가인 노인이 자가인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자존감 및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연령이 젊은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자살생각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노인일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의 빈곤여부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비교분석 결과, 빈곤노인의 경우 일반노인과 비교했을 때,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노인 집단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들 중 공공부조 수급자의 정신건강 돌봄 필요성, 경제 활동 참여의 필요성, 안정적인 주거보장의 필요성 등과 같은 세부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노인의 자살생각이 비수급노인에 비해 약 1.3배 가량 높게 나왔는데, 이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초기 자살위험성 수준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전해숙, 2016). 다만 전해숙(2016)의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자살위험성 격차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자살생각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다는 결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수급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급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 인생의 끝자락을 남의 도움을 받아 살면서 내일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혜인, 주경희, 김희주, 김세원, 2015, pp.974-977). 공공부조 수급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노인과 빈곤노인 모두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요인은 일반노인의 경우만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았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빈곤노인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혼자 사는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이 다른 가구구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빈곤노인 중 혼자 사는 남성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빈곤과 자살생각 문제의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회복지 제언을 제공하였다.
첫째, 빈곤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65세 이상 한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연간가구소득이 낮은 빈곤집단일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pp.370-371 ).8) 본 연구에서도 연간소득이 적고 미취업상태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에는 빈곤노인,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규모 기업체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빈곤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및 수립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분석 대상의 30% 이상의 주거형태가 자신의 집이 아닌 전월세 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 기에 새로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관계 및 환경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래 살아온 친숙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Aging in Place’의 개념(오찬옥, 2008)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제언할 수 있다.
셋째, 빈곤 남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남성독거노인은 가족 및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되기 쉽고, 여성에 비해 식사, 청소 등 일상생활문제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다중적 어려움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조용운, 한창근, 2014, pp.296-297). 여기에 빈곤이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질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현황 및 복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에 기본적 가사・일상생활지원 외에도 정신건강 관리 영역을 추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및 친지 등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독거노인들이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넷째,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노인의 자살생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복지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노인은 전체 빈곤노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빈곤층에 해당되는 집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현금지원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노인의 자활과 행복이 보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수급자들의 인권보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노인자살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검증된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복지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2000년 이후 각 시군구를 중심으로 기초・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울수준이 높은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별 공공 사례관리 체계에서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우울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자원 의뢰・연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관, 보건소 및 병의원, 요양기관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 효과성이 검증된 개입프로그램(예: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임금선, 김현실, 2012))들이 적극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빈곤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욕구보다는 만성질환에 따른 신체적 건강문제나 배우자 및 사회적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복지 욕구에 초점을 둔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자살생각의 개입전략이 노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연구범위의 제한으로 노년기 빈곤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인과관계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초분석 결과 노인자살과 우울수준의 연도별 추이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수준에 따른 구분을 통해 고위험 집단과 정상 집단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수준, 사회참여 수준 등의 변수들은 고려하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어떠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지 등 종단적인 경로의 분석, 자살생각 경험의 변화추이와 성장률에 대한 종단연구 등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Notes
분석기간 동안 2014년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높은 것은 당시 ‘세월호 사건’이라는 전국가적 재난 경험과의 연결하여 추정해볼 수 있음. 재난 상황은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건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DeWolf, 2000). 실제 질병관리본부(2015, p.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에서 2009년 및 2013년에 비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이후의 자살생각률이 증가하였고, 노인자살의 강력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 등 부정적 정서 역시 세월호 사건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조명현, 장재윤, 유경, 이주일, 2015, p.671).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7, p.385)의 자살생각 비율은 60~69세 3.9%, 70세 이상 2.6% 수준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2015년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낮았음. 반면 국민건강통계(2016a, p.114)의 자살생각 비율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우울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음. 척도는 0~3점 척도로 구성된 11문항으로 구성되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으로 하였음. 우울점수=(점수화한 11개 우울지표 항목의 합)×20/11. 한편 국민건강통계 추이(2016b, p.60)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고위험군 비율은 2012년 16.5%, 2013년 14.8%, 2015년 16.2% 수준으로 본 연구에 비해 비교적 낮았음.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VIF를 측정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 값은 0.7 이하로 나타났고, VIF값 역시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한편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일치추정량 판단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H0 : coυ(xij, ui) = 0)을 한 결과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1 보다 작게 나와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음(민인식, 최필선, 2012, p.246).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성별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불변 변수가 자동으로 누락된다(민인식, 최필선, 2012, p.243)는 한계를 가짐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함. 노인자살 및 빈곤의 문제에 있어 성별요인에 대한 결과해석과 함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References
. (2017).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index.php에서 2017.1.25. 인출
(2017). Suicide Statistics. https://afsp.org/about-suicide/suicide-statistics/에서 2017.2.23. 인출
, , &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PubMed]
, , , , , , & (2004). Reducing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depressed older primary care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91(9), 1081-1091. [PubMed]
, , &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3), 193-204. [PubMed]
, , , , & (2003). Why are suicide rates rising in young men but falling in the elderly?: A time-series analysis of trends in England and Wales 1950-1998. Social Science &Medicine, 57, 595-611. [PubMed]
, , , , & (2006). Life problems and physical illness as risk factors for suicide in older people: a descriptive and case-contro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6(9), 1265-1274. [PubMed]
, , &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attempted suicide: converging evidence from four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231-237. [PubMed]
, , & (2016). Suicide,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2, 307-330. [PubMed]
, , & (2013). Differential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gender-and age-defined suicidal ideation among adult and elderly individuals in South Korea. Psychiatry research, 210(1), 323-328. [PubMed]
, , & (2003).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end-of-life despair in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The lancet, 361(9369), 1603-1607. [PubMed]
, , , , , , & (1988). Operational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suicid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3(6), 1445-1456. [PubMed]
, , , & (2001). Life events and psychosocial factors in elderly suicides-a case-contro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1(7), 1193-1202. [PubMed]
, , , , , , & (2013). Suicide among the elderly and associated factors in South Korea. Aging &mental health, 17(1), 109-114. [PubMed]
(2017). Suicides and suicide rate, by sex and by age group. http://www.statcan.gc.ca/tables-tableaux/sum-som/l01/cst01/hlth66d-eng.htm에서 2017.2.23. 인출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esa.un.org/unpd/wpp에서 2017.2.23. 인출
, & (2005). Social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Aging &mental health, 9(6), 517-525. [PubMed]
, , & (2002).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old elderly. Gerontology, 49(5), 328-334. [PubMed]
, , , , , & (2003). A prevalence study of suicide ideation among older adults in Hong Kong SAR.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11), 1056-1062.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4-19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7-04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7-24

- 4782Download
- 2586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