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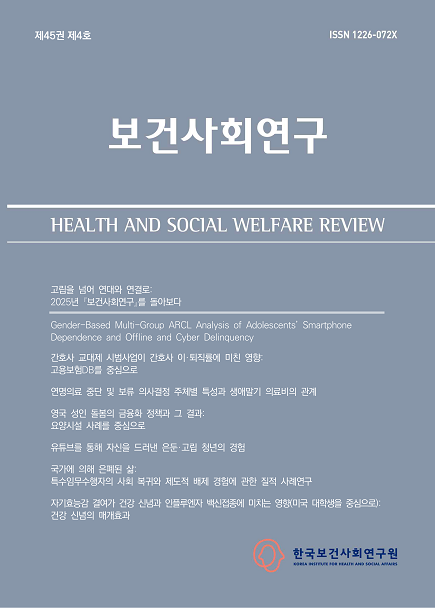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atus Change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on Maintaining Good Job and Moving for Better Job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Song, Jin Yeo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3, pp.260-289, Sept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3.26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orkplac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wage workers influences on maintaining good job and moving for better job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Using the data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for the third and the seventh year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Agency, this study is targeting a total of 686 disabled wage workers under the aged of 65 among 5,092 disabled individuals registered in the agency. This data is analyz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to examine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effect on employment retention in favorable jobs and job mobilit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istent ab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as confirmed to have an positive influence on maintaining good job. Second, a change to the ab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as determined to have negative effect on maintaining good job. Third, a change to the pre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oving for better job. Based on what has been found so far, the study provid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secure good job retention and better job mobility of disabled wage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등록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부합한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장애인 68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 간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Ⅰ. 서론
장애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은 단순히 장애인 개인의 소득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김근홍 등, 2005, p.302). 장애인고용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권리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으로 비장애인과의 고용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생활에서의 안정성과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근로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완식 등, 2009, p.10).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 말 현재 2,490천명에 달하여 전체 국민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상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은 다른 취약한 계층보다 훨씬 높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9).
한편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직무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김광자, 2011, p.92). 그나마 장애인들을 채용한 기업들도 그들을 단순 업무와 생산성이 낮은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9). 이렇듯 장애인들은 일자리에서 열악한 근무조건 등 차별을 받는 대상이며, 이와 같은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은 그들의 직무의 질뿐만 아니 라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Bardasi & Francesconi, 2004; Beckles, 2004).
최근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이 많으며,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을 저해한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경험이 고용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한 연구(강동욱, 이혁구, 2008, p.20; Sirvastava & Chamberlain, 2005),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이 정규직과 직무지속 가능성 등의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김태용, 2014, p.59), 임금근로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은 정규직여부, 직무안정성, 직무지속가능성 등을 하위변수로 한 고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진영, 2014, p.339)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횡단적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취업 관련한 종단적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경제활동상태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정우근(2016, p.159)의 연구와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취업결정상태변화에 영향이 있다고 한 이채식, 김명식(2015, p.20) 의 연구 등 일부 연구가 본 주제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횡단적인 연구들 대부분은 유의표집에 의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설계에 기초한 연구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제한적인 종단적인 연구는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과 좋은 일자리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론과 인과관계 규명의 한계를 넘어 전국단위규모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상태에 대한 종단적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 등 일자리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 등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임금근로장애인의 장애차별을 지속적으로 차별이 없음, 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차별이 있음과 같이 4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 간의 영향관계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일자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로써 매우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전국 규모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까지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가 그들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차별경험의 상태에 따라 그들의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 또는 이동의 상태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의 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그들의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관점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는 그들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는 그들의 좋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일자리차별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5년 말 현재 2,490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240천명에 비해 10배 이상, 2000년도 958천명 대비 161%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38.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9).
차별(discrimination)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특정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이다(윤은경, 2015, p.115). 이미라(2011, p.14)는 차별을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적 차별로 나뉘었는데, 합리적 차별이란 자격요건이나 특정 능력에 근거한 차별을, 불합리적 차별은 업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다루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장애차별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나운환 등, 2003, p.355), 장애차별실태에 관한 연구(이미라, 2011, p.14), 임금근로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송진영, 2014, p.329; 송진영, 김형모, 2014, p.5)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37.8%, 취업에서 35.8%, 소득에서 23.9%, 일자리에서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20.0%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차별수준을 살펴본 결과, ‘약간 많다’ 가 44.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별로 없다’가 28.1%, ‘매우 많다’가 26.3% 순으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없다’는 1.0%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지 못한다’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가 23.7%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2014, p.364).
2.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
일자리 이동은 노동이동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나 두 개념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노동이동은 노동시장 내 산업 간, 사업체 간, 직종 간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출입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반면, 일자리 이동은 동일직장 내 하고 있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동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미, 2009, p.129). 민현주, 임희정(2009)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과 같은 고용형태 간 이동 또는 조직 내 일자리 변경도 일자리 이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동이동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함께 고려하는 폭넓은 이동의 개념이며, 일자리 이동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직장 내부에서의 이동, 정규직으로의 이동, 그리고 직장 간 이동을 설명하는 노동이동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자리 이동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고용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희 등(2009, p.8) 와 김경휘(2011, p27)는 종단연구를 통해 취업, 실업, 비경활 등 특정 노동력 상태에서 머물 확률이 낮아지고 서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얻고자 스스로 일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자발적 이동이든 비자발적 이동이든 일자리 이동은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김성훈, 2007, p.287; 최영란, 2017, p.88).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이동이 모두 상향이동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Johnson & Corcoran, 2003; Johri, 2005).
좋은 일자리 이동과 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개념은 직무와 환경, 그리고 근로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영애(2014, p.1)의 연구 이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연구한 변경희(2010, p.203)는 노동시장에서 사용하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한다고 하였다.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희(2010, p.203)는 임금, 직무수준, 직장배려, 직무만족도를 제시하였으며, 이운식(2010, p.4)은 근무조건, 보상, 관계,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장애인식 및 태도를 제시하였다. 김영애(2014, p.43)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을 좋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이라고 하였다. 김영애(2014, p.43)가 정의한 임금은 OECD에서 제시한 저임금 근로자 기준인 월평균 중위소득의 2/3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연구하였다(남춘호, 2011, p.43; 박자경, 2013, p.262; 장숙, 김영애, 2015, p.250; 박용순, 2017, p.67). 2016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624,831원이다(통계청, 2016). 고용안정성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규직여부나 상용직여부를 사용하는데, 상용직 여부는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축면이 있어, 김영애(2014, p.43) 등 일부연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고용안정성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정규직여부를 사용한 논문으로는 송진영(2014, p.337), 이운식, 나운환(2011, p.10), 최지선(2009, p.322), Mauno et al.(2005) 등이 있다. 근로시간은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될 수 있는데, OECD에서는 국제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시간제 근로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당 30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제근로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게 근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이옥진, 2013, p.14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김영애(2014, p.43)와 장숙・김영애(2015, p.250) 등의 정의를 토대로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면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의 유지는 ‘3차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가졌던 장애인이 7차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로, 좋은 일자리 이동은 ‘3차년도에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가졌던 장애인이 7차년도에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는지의 여부’로 정의한다.
3.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요인
그동안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 취업결정요인, 고용안정 및 직업유지 요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초점을 두고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김영애(2014, p.43)와 장숙과 김영애(2015, p.250)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좋은 일자리와 밀접한 고용안정성 또는 직업유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인 일자리차별의 요인과 일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가. 일자리차별의 요인
장애인은 장애라고 하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일자리에서도 장애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장애인들 대부분은 만성적인 질환과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 경제활동참가율은 46.4%인데 반해, 중증장애인들은 각각 19.7%, 21.7%로서 경증장애인의 절반정도도 안 되는 수준에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9). Bardasi와 Francesconi(2004), Beckles(2004), 장정미 등(2009, p.237) 등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고 직무에서의 소외,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자리장애차별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경험과 좋은 일자리 간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강동욱과 이혁구(2008, p.20), Sirvastava와 Chamberlain(2005)은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경험이 고용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김태용(2014, p.59)에 의하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정규직과 직무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고용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송진영(2014, p.337)은 임금 근로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차별은 정규직여부, 직무지속가능성, 직무안정성 등으로 구성된 고용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현(2015, p.77)는 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은 좋은 일자리에 부적(-)인 영향을 보임을 밝혔다. 강동욱(2004, p.137)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취업 시 33.4%의 차별을 경험하며, 임금에서는 67.3%의 차별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오욱찬(2013, p.20)은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수준은 비장애인의 6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성희, 정병오(2011, p.200) 등 일부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반적 요인
장애인의 일자리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수준, 건강상태, 만성질환, 타인의 도움여부 등의 건강 요인, 일자리상태 및 일자리 부합정도 등의 일자리 요인,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경제 요인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 이운식, 나운환(2011, p.15)은 남성장애인일수록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세연 등(2012, p.324)에서는 여성장 애인일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승미(2014, p.67) 에서는 성별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연령은 좋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운식(2010, p.21)은 장애인근로자들은 30대에 고용의 질이 가장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특히 고령층인 경우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경희(2010, p.201)도 연령은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에 부적 (-)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연령이 고용안정성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김세연 등, 2012, p.320). 이운식, 나운환(2011, p.17)은 학력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반면, 김세연 등(2012, p.320)는 학력은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미(2014, p.67)는 기혼자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높다고 하였으나, 김세연 외(2012, p.323)는 결혼여부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이운식(2010, p.61)은 경증장애인일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경희(2010, p.202)의 연구에서는 최중증인 1급과 최경증인 6급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나, 2급, 3급, 4급 장애인들의 일자리의 질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장애정도는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용현(2015, p.77)은 장애인들은 건강할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함을 밝혔다. 송진영(2014, p.333)은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고용안정성이 좋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도움정도는 고용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일자리 요인에서, 하승미(2014, p.67)는 일자리의 안전상황은 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영향이 없는 변수였으며, 교육훈련이나 직종의 적합성 등 전공이나 적성부합여부 또한 장애인의 고용의 질과 무관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세현 등(2012, p.323)과 이운식 (2010, p.61)은 장애인들은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생산직과 같은 낮은 안전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업환경 역시 고용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송진영(2014, p.333)은 종교는 고용안정성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정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 이동과 유지의 상태변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자료’ 중 2011년에 배포한 제3차년도와 2015년도 배포한 제7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등록된 장애인 5,092명 중 3차년도 패널자료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3,221명을 추출하고, 이 중에서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686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688명의 임금근로장애인 중 좋지 않은 일자리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472명이었으며, 좋은 일자리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214명이었으며, 7차년도까지 임금근로를 유지한 장애인은 총 553명이었다.
3차년도에 좋지 않은 일자리상태였던 장애인 472명 중에서 임금근로를 유지한 경우는 343명이었으며, 이중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44명, 좋지 않은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는 3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 대상자 214명 중에서 임금근로를 유지한 경우는 210명이었으며, 이중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는 166명,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1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고용패널의 초기 자료로서 1차년도를 사용하지 않고 3차년도를 사용한 이유는 일자리차별 변수가 3차년도 이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가. 일자리차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패널에서 제공한 항목 중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까지의 ‘일자리에서의 차별정도’를 ‘0= 차별경험이 없음’, ‘1=차별경험이 있음’의 ‘일자리차별경험’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일자리차별의 상태를 일자리차별은 ‘1=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유지: 제3차년도 이후 계속 차별이 없음’, ‘2=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차별이 없음에서 제7차년도 현재 차별이 있음으로 변화’, ‘3=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차별이 있음에서 제7차년도 현재 차별이 없음으로 변화’, ‘4=일자리차별이 있음을 유지: 제3차년도 이후 계속 차별이 있음’ 등 4개의 변수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은 ‘좋은 일자리여부’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으로서, 제3차년도에서 임금근로장애인이면서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임금근로장애인 중에서 제7차년까지 임금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를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으로서, 제3차년도에서 임금근로장애인이면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장애인 중에서 제7차년도까지 임금근로를 유지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좋은 일자리여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이 중위소득의 2/3이상이면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이면 좋은 일자리로서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유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등의 4개의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회귀분석에서는 패널에서 제공한 비율변수를 변환없이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위해 ‘100만원 미만을 1,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을 2, 200만 이상~300만원 미만을 3, 300만원 이상을 4’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전일제 근무여부와 정규직여부는 ‘아니요’를 0, ‘예’를 1로 더미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생성하였다.
if (f(n 차좋은일자리) = (n 차월평균임금 > 1,083,221 원) and (n 차전일제여부 = 1) and (n 차정규직여부 = 1) = 1 else 0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일반적 요인, 장애/건강요인, 일자리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1). 일반적 요인 중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해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연령은 회귀분석에서는 패널에서 구성한 비율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빈도분석을 위해서는 ‘20대를 1, 30대를 2, 40대를 3, 50대를 4, 60대를 5’와 같이 연령대로 재구성하였다. 학력은 ‘무학을 1, 초등학교 졸업을 2, 중학교 졸업을 3, 고등학교 졸업을 4, 대졸 이상을 5’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배우자동거여부는 ‘기타(0: 미혼, 이별, 사별, 별거), 배우자동거는 1’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종교여부는 ‘없음을 0, 있음을 1’로 더미처리하였다.
건강요인 중에서 장애정도는 ‘경증을 0, 중증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을 ‘1’에서 ‘매우 좋음’을 ‘4’로 구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만성질환보유여부는 ‘없음을 0, 있음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타인의 도움필요정도는 ‘전혀 필요없음 1, 필요없음 2, 약간 필요함 3, 매우 필요함 4’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자리요인 중에서 일자리 안전상황은 ‘매우 위험함’이 1, ‘위험한 편임’이 2, ‘안전한 편임’이 3, ‘매우 안전함’이 4’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변환없이 사용하였으며, 일자리 적성부합정도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이 1, ‘부합하지 않는 편임’이 2, ‘부합하는 편임’이 3, ‘매우 부합함’이 4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변환 없이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요인 중에서 종교보유여부는 ‘없음을 0, 있음을 1’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을 0, 중층 이상을 1’로 더미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좋은 일자리의 구성요소와 주요 변수의 하위요소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와 종속변수인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 간에 어떠한 평균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수인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일반적 요인 중에서 성별은 남성이 75.1%로서 여성의 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42.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40대가 26.5%, ‘60~64세’가 20.3%, 30대가 8.6%, 20대가 1.9% 순으로 분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졸업’ 20.0%, ‘중학교 졸업’ 17.3%, ‘대졸 이상’ 15.7%, ‘무학’ 8.2%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대상자는 68.2%로서 절반 이상을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 = 686명) | ||||
|---|---|---|---|---|
| 요인 | 변수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일반적 요인 | 성별 | 여성 임금근로장애인 | 171 | 24.9 |
| 남성 임금근로장애인 | 515 | 75.1 | ||
| 연령대 | 20~29세 | 13 | 1.9 | |
| 30~39세 | 59 | 8.6 | ||
| 40~49세 | 182 | 26.5 | ||
| 50~59세 | 293 | 42.7 | ||
| 60~64세 | 139 | 20.3 | ||
| 학력 | 무학 | 56 | 8.2 | |
| 초졸 | 137 | 20.0 | ||
| 중졸 | 119 | 17.3 | ||
| 고졸 | 266 | 38.8 | ||
| 대졸 이상 | 108 | 15.7 | ||
| 배우자동거여부 | 기타(미혼, 이별, 사별, 별거) | 218 | 31.8 | |
| 배우자와 동거 | 468 | 68.2 | ||
| 장애/ 건강요인 | 장애정도 | 경증장애 | 513 | 74.8 |
| 중증장애 | 173 | 25.2 | ||
| 건강상태 | 매우 좋지 않음 | 16 | 2.3 | |
| 좋지 않은 편임 | 280 | 40.8 | ||
| 좋은 편임 | 372 | 54.2 | ||
| 매우 좋음 | 18 | 2.6 | ||
| 만성질환여부 | 아니요 | 382 | 55.7 | |
| 예 | 304 | 44.3 | ||
| 타인도움 필요정도 | 전혀 필요없음 | 261 | 38.0 | |
| 필요없음 | 315 | 45.9 | ||
| 약간 필요함 | 97 | 14.1 | ||
| 매우 필요함 | 13 | 1.9 | ||
| 일자리 요인 | 일자리 안전상황 | 매우 위험함 | 3 | .5 |
| 위험한 편 | 127 | 23.0 | ||
| 안전한 편 | 348 | 62.9 | ||
| 매우 안전함 | 75 | 13.6 | ||
| 일자리 적성부합 정도 | 전혀 부합하지 않음 | 18 | 3.3 | |
| 부합하지 않는 편 | 125 | 22.6 | ||
| 부합하는 편 | 354 | 64.0 | ||
| 매우 부합함 | 56 | 10.1 | ||
| 사회경제 적 요인 | 종교보유유무 | 없음 | 429 | 62.5 |
| 있음 | 257 | 37.5 | ||
| 사회경제적 지위 | 하층 | 291 | 42.4 | |
| 중상층 이상 | 395 | 57.6 | ||
장애 및 건강요인 중에서 장애정도는 경증이 74.8%로서 중증에 비해 상당히 높게 분포되었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54.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지 않은 편이다’ 40.8%, ‘매우 좋다’ 2.6%, ‘매우 좋지 않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여부는 없는 대상자가 55.7%로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 도움의 필요정도는 ‘필요없다’가 45.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없다’도 38.0%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요인 중에서 일자리 안전상황은 ‘안전한 편임’이 62.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위험한 편임’ 23.0%, ‘매우 안전함’ 13.6%, ‘매우 위험함’ 0.5% 순으로 분포되었다. 일자리 적성부합정도는 ‘부합하는 편임’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합하지 않는 편임’ 22.6%, ‘매우 부합함’ 10.1%, ‘매우 부합하지 않음’ 3.3% 순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62.5%로서 있는 경우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 이상인 경우가 57.6%로서 하층의 42.4%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2. 주요 변인들의 특성
좋은 일자리의 구성요소인 전일제 근무여부, 정규직여부, 월평균임금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좋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들의 특성(n = 제3차년도 686명, 제7차년도 615명)
| 변수명 | 범주 | 제3차년도 | 제7차년도 | ||
|---|---|---|---|---|---|
|
|
|
||||
| n | % | n | % | ||
|
|
|||||
| 전일제근무여부 | 전일제 근무 | 587 | 85.6 | 488 | 88.2 |
|
|
|||||
| 시간제 근무 | 99 | 14.4 | 65 | 11.8 | |
|
|
|||||
| 정규직여부 | 정규직 근로 | 273 | 39.8 | 240 | 43.4 |
|
|
|||||
| 비정규직 근로 | 413 | 60.2 | 313 | 56.6 | |
|
|
|||||
| 월평균임금 | 100만원 미만 | 266 | 38.8 | 129 | 23.3 |
|
|
|||||
|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 | 277 | 40.4 | 242 | 43.8 | |
|
|
|||||
| 200만 이상~300만원 미만 | 91 | 13.3 | 116 | 21.0 | |
|
|
|||||
| 300만원 이상 | 52 | 7.6 | 66 | 11.9 | |
먼저 전일제근무여부는 제3차년도 패널자료에서는 587명(85.6%)이였으나, 제7차년도는 488명(88.2%)으로 제3차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제3차년도에서는 39.8%의 분포를 보였으나, 제7차년도에서는 43.4%로 제3차년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은 제3차년도에서는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이 40.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100만원 미만’이 38.8%로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제7차년도에서는 ‘200만 이상~300만원 미만’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이 23.3%, ‘200만 이상~300만원 미만’이 21.0%, ‘300 만원이상’이 11.9% 순으로 분포됨에 따라, 제7차년도의 월평균임금이 제3차년도의 월 평균임금에 비해 조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일자리차별 상태의 특성과 좋은 일자리의 상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는 제3차년도의 상태에서 제7차년도의 상태로의 변화로서, 일자리차별상태를 ‘일자리차별 없음을 유지’,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음’등의 4개의 변수가 있다. 먼저 일자리차별 없음을 유지한 경우는 60.5%이었으며,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6.2%,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21.5%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음을 유지한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특징
| 변수명 | 범주 | n | % |
|---|---|---|---|
| 일자리차별 | 일자리차별 없음을 계속 유지 | 352 | 60.5 |
| 일자리차별 없음에서 있음 전환 | 36 | 6.2 | |
| 일자리차별 있음에서 없음 전환 | 125 | 21.5 | |
| 일자리차별 있음 계속 유지 | 69 | 11.9 | |
|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 44 | 8.0 |
|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 | 325 | 58.7 | |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166 | 30.0 | |
|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동 | 18 | 3.3 |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의 상태변화는 제3차년도의 상태에서 제7차년도의 상태 변화로의 변화로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 ‘좋은 일자리의 유지’,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등의 4개의 변수가 있다. 이 중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전체 중 8.0%로 나타났으며, 좋지 않은 일자리의 유지는 58.7%, 좋은 일자리를 지속 적으로 유지한 경우는 30.0%, 좋지 않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3.3%로 나타났다.
3.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는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음,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4개의 변수는 동시에 함께 나타날 수 없는 속성을 가지므로, 이들 각각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이고 두 집단을 가진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의 유무인 관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표 4>는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값 이 186.947(p<.001)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음’의 B값은 .896(O.R=2.449, p<.001)로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그룹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2.449배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일자리에 적성이 부합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좋은 일자리 이동 | ||||
|---|---|---|---|---|---|---|
|
|
|
|||||
| B | Wals | Exp(B) | B | Wals | Exp(B) | |
|
|
||||||
| 성별 | 1.681 | 20.395 | 5.370*** | -.690 | 2.926 | .502 |
|
|
||||||
| 연령 | -.022 | 1.917 | .979 | -.031 | 1.904 | .969 |
|
|
||||||
| 학력 | .688 | 26.184 | 1.991*** | .253 | 1.926 | 1.288 |
|
|
||||||
| 배우자동거 | .709 | 5.646 | 2.033* | -.141 | .140 | .868 |
|
|
||||||
| 장애정도 | -.519 | 2.985 | .595 | -.132 | .093 | .877 |
|
|
||||||
| 건강상태 | .203 | .762 | 1.225 | .049 | .021 | 1.050 |
|
|
||||||
| 만성질환여부 | -.357 | 1.879 | .700 | .286 | .577 | 1.331 |
|
|
||||||
| 타인도움필요 | .152 | .752 | 1.164 | -.115 | .209 | .892 |
|
|
||||||
| 일자리안전 | .077 | .144 | 1.080 | -.649 | 4.898 | .522* |
|
|
||||||
| 일자리적성 | .634 | 11.615 | 1.884** | .402 | 2.120 | 1.495 |
|
|
||||||
| 종교보유여부 | .102 | .184 | 1.107 | -.018 | .003 | .982 |
|
|
||||||
| 사회경제지위 | .551 | 7.863 | 1.736** | -.003 | .000 | .997 |
|
|
||||||
| 차별없음유지 | .896 | 13.081 | 2.449*** | -.255 | .557 | .775 |
|
|
||||||
| -2 Log우도 | 487.407 | 290.812 | ||||
| NagelkerkeR2 | .408 | .067 | ||||
| X2 | 186.947***(df = 13) | 16.001(df = 13) | ||||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 값이 16.001(p>.05)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음’의 B값은 -.255(p>.05)로서,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는 좋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
<표 5>은 일자리차별이 3차년도 이후 있다가 7차년도 현재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값이 185.905(p<.001)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일자리차별이 있다가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의 B값은 -1.053(O.R=.349, p<.01)으로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그룹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이 있다가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0.349배로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일자리에 적성이 부합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좋은 일자리 이동 | ||||
|---|---|---|---|---|---|---|
|
|
|
|||||
| B | Wals | Exp(B) | B | Wals | Exp(B) | |
|
|
||||||
| 성별 | 1.640 | 19.477 | 5.155*** | -.684 | 2.880 | .505 |
|
|
||||||
| 연령 | -.019 | 1.435 | .981 | -.029 | 1.703 | .971 |
|
|
||||||
| 학력 | .706 | 27.638 | 2.026*** | .252 | 1.943 | 1.287 |
|
|
||||||
| 배우자동거 | .712 | 5.707 | 2.038* | -.148 | .154 | .862 |
|
|
||||||
| 장애정도 | -.629 | 4.462 | .533* | -.104 | .059 | .901 |
|
|
||||||
| 건강상태 | .227 | .955 | 1.255 | .016 | .002 | 1.016 |
|
|
||||||
| 만성질환여부 | -.303 | 1.378 | .739 | .247 | .437 | 1.281 |
|
|
||||||
| 타인도움필요 | .133 | .585 | 1.142 | -.085 | .115 | .919 |
|
|
||||||
| 일자리안전 | .070 | .120 | 1.072 | -.639 | 4.756 | .528* |
|
|
||||||
| 일자리적성 | .643 | 11.991 | 1.902** | .392 | 2.022 | 1.479 |
|
|
||||||
| 종교보유여부 | .132 | .313 | 1.141 | -.024 | .005 | .976 |
|
|
||||||
| 사회경제지위 | .572 | 8.508 | 1.772** | -.035 | .015 | .966 |
|
|
||||||
| 차별없음변화 | -1.053 | 11.404 | .349** | -.170 | .166 | .844 |
|
|
||||||
| -2 Log우도 | 488.449 | 291.192 | ||||
| NagelkerkeR2 | .406 | .065 | ||||
| X2 | 185.905***(df = 13) | 15.620(df = 13) | ||||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 값이 15.620(p>.05)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의 B값은 -.170(p>.05)으로서, 좋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
<표 6>은 일자리차별이 3차년도 이후 없다가 7차년도 현재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값이 173.612(p<.001)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의 B값은 .264(p>.05)로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좋은 일자리 이동 | ||||
|---|---|---|---|---|---|---|
|
|
|
|||||
| B | Wals | Exp(B) | B | Wals | Exp(B) | |
|
|
||||||
| 성별 | 1.625 | 19.705 | 5.077*** | -.720 | 3.123 | .487 |
|
|
||||||
| 연령 | -.021 | 1.824 | .979 | -.030 | 1.715 | .971 |
|
|
||||||
| 학력 | .684 | 25.912 | 1.982*** | .260 | 2.005 | 1.297 |
|
|
||||||
| 배우자동거 | .677 | 5.346 | 1.967* | -.205 | .295 | .814 |
|
|
||||||
| 장애정도 | -.653 | 4.954 | .520* | -.157 | .131 | .855 |
|
|
||||||
| 건강상태 | .300 | 1.708 | 1.350 | .062 | .033 | 1.064 |
|
|
||||||
| 만성질환여부 | -.265 | 1.083 | .767 | .279 | .560 | 1.322 |
|
|
||||||
| 타인도움필요 | .130 | .583 | 1.139 | -.077 | .097 | .926 |
|
|
||||||
| 일자리안전 | .054 | .073 | 1.056 | -.649 | 4.782 | .523* |
|
|
||||||
| 일자리적성 | .620 | 11.515 | 1.859** | .404 | 2.112 | 1.497 |
|
|
||||||
| 종교보유여부 | .132 | .324 | 1.142 | .056 | .026 | 1.058 |
|
|
||||||
| 사회경제지위 | .633 | 10.787 | 1.883** | -.032 | .013 | .969 |
|
|
||||||
| 차별있음변화 | .264 | .361 | 1.302 | 1.196 | 5.592 | 3.307* |
|
|
||||||
| -2 Log우도 | 500.742 | 388.664 | ||||
| NagelkerkeR2 | .383 | .184 | ||||
| X2 | 173.612***(df = 13) | 80.149*(df = 13) | ||||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 값이 80.149(p<.05)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 으로 변화된 경우의 B값은 1.196(O.R=3.307, p<.05)로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그룹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이 없다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3.307배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일자리 안전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표 7>은 일자리차별이 3차년도 이후 7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좋은 일 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값이 176.144(p<.001)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음’의 B값은 .683(p>.05)으로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할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일자리에 적성이 부합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 변수명 | 좋은 일자리의 유지 | 좋은 일자리 이동 | ||||
|---|---|---|---|---|---|---|
|
|
|
|||||
| B | Wals | Exp(B) | B | Wals | Exp(B) | |
|
|
||||||
| 성별 | 1.657 | .367 | 5.246*** | -.675 | 2.802 | .509 |
|
|
||||||
| 연령 | -.022 | .016 | .978 | -.030 | 1.815 | .970 |
|
|
||||||
| 학력 | .678 | .135 | 1.970*** | .247 | 1.857 | 1.280 |
|
|
||||||
| 배우자동거 | .666 | .293 | 1.947* | -.151 | .161 | .859 |
|
|
||||||
| 장애정도 | -.586 | .296 | .557* | -.094 | .047 | .910 |
|
|
||||||
| 건강상태 | .291 | .229 | 1.338 | .023 | .005 | 1.023 |
|
|
||||||
| 만성질환여부 | -.294 | .256 | .746 | .248 | .437 | 1.281 |
|
|
||||||
| 타인도움필요 | .147 | .172 | 1.158 | -.087 | .120 | .917 |
|
|
||||||
| 일자리안전 | .065 | .201 | 1.067 | -.637 | 4.690 | .529* |
|
|
||||||
| 일자리적성 | .621 | .183 | 1.860** | .394 | 2.046 | 1.483 |
|
|
||||||
| 종교보유여부 | .129 | .233 | 1.137 | -.028 | .007 | .973 |
|
|
||||||
| 사회경제지위 | .613 | .193 | 1.845** | -.030 | .012 | .970 |
|
|
||||||
| 차별있음유지 | -.683 | .416 | .505 | -.122 | .046 | .885 |
|
|
||||||
| -2 Log우도 | 498.211 | 291.316 | ||||
| NagelkerkeR2 | .388 | .065 | ||||
| X2 | 176.144***(df = 13) | 15.496(df = 13) | ||||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석모형은 X² 값이 15.496(p>.05)으로서 적합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있음’의 B값은 -.122(p>.05)로서, 좋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그들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전국 규모의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장애인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임금근로장애인의 비율은 8.0%로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층이나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 이동률이 저조한 것과 동일한 연구결과이다(최옥금, 2005, p.30), 또한 노동시장 구조상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임금수준도 낮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고, 승진의 기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의 불안전성이 심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임금근로를 유지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으며, 이는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빈곤 등의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와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와 일자리차별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장애인 들은 일자리에서 차별이 없는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자리에서 장애차별이 있는 경우는 좋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차별이 고용안정에 영향이 있다고 한 송진영 (2014, p.337), 이지수와 서정희(2014, p.8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차별이 없음이 유지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반면,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좋은 일자리의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자리차별이 있다가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에 좋지 않은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결과는 현재시점에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즉, 일자리차별이 있었던 시점에 이미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보여진다.
셋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와 일자리차별이 있음 또는 없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 이동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일자리차별이 없다가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에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자리차별이 있다가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경우에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느 한 시점에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은 이후 차별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이전의 차별경험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의 유지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주나 담당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만약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과 장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교육과 성공한 사례를 기업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실천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장애인고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인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
둘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서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자리차별이 없었던 시점에 이미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준비하였음을 예측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유추하기 위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일자리차별이 지속적으로 없는 비율은 44.8%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55.2%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임금근로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 특히, 차별을 받지 않다가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선택은 사직, 무시, 소송 등이 있을 수 있다(이지수, 서정희, 2014, p.82). 사직은 현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나, 근로 조건의 향상이 기대되지 않아 자신이 일자리에 대한 헌신이 낮다고 인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Balser, 2000).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경험은 그들의 고용안정성이나 직무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지선, 2009, p.328; 송진영, 2014, 337; 이지수, 서정희, 2014, p.82).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그들의 직무불만족과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좋은 일자리로 이동 즉, 사직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본 연구와 같이 장애차별이 없다가 있는 경우에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이유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장애차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가 임금근로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재직훈련 비용지원에 추가하여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의 유지 또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및 재직훈련, 전직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애인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장애인들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이동과 유지의 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차별의 상태변화요인을 중심으로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이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차별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 상태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별도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과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후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 현재 일자리차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줄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재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저임금 근로가 아니면서 전일제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은 기업이나 국가,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보완한다면, 그들의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Notes
패널자료의 종단분석에서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를 어느 시점에 측정된 변수들로 사용할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Gollob & Reichardt(1987) 에 의한 방법론에 근거한 시차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최초의 변수의 상태와 최종년도의 변수 중 어떠한 차수가 종속변수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를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제변수들이 제3차년도 보다는 제7차년도의 패널자료가 좋은 일자리의 상태변화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모든 통제변수들을 제7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7-17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9-16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9-21

- 1427Download
- 1844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