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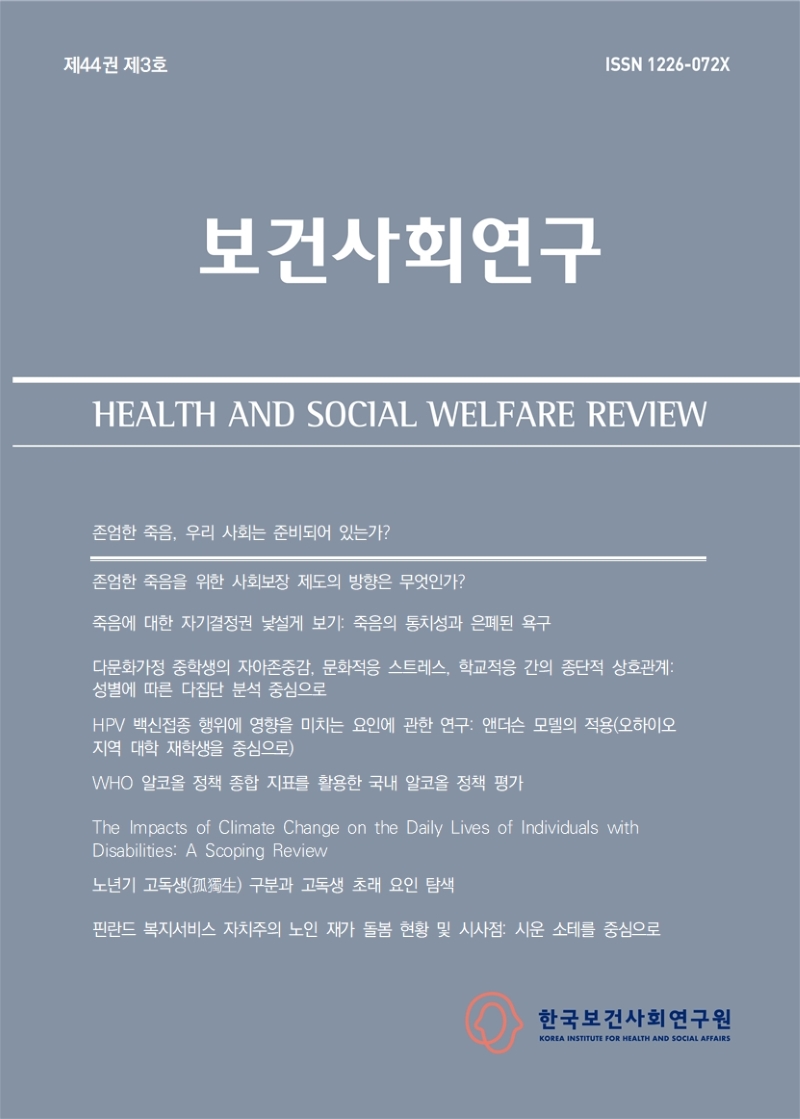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중심으로
Longitudinal Intercausal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Focus on Gender Multigroup Analysis
Kim, Eun Hye1; JUNG, SUN JAE1*
보건사회연구, Vol.44, No.3, pp.28-51,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3.28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인간발달적 관점에 따라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이 연구는 사춘기 시기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심리(자아존중감)·사회(학교적응)·문화(문화적응 스트레스)적 측면 간의 상호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상호관계 결과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상호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 관계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중학생 남녀의 심리·사회·문화적 상호관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학년 전환기 초기시점인 중학교 1학년 입학시점부터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비다문화와 다문화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employing an autoregressive lagged model to enhance the well-being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Data (MAPS 1) covering the 4th to the 6th academic years of 1,316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the self-lagged effects of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on stress were stable over time. Specifically,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at earlier time poin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factors at later time points for both boys and girls. Second, a gender comparison of the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distinct patterns. For boys, there were significant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betwee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stress. Moreover, school adjustment significantly affected acculturation stress. For girls, earlier self-esteem influenced later acculturation stress, while prior school adjustment affected subsequent self-esteem.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acculturation stress in supporting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 복지의 함양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APS 1기) 중 중학생 시기인 4~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포함된 다문화가정 중학생 수는 1,316명이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지연 효과검증을 통한 성별 비교 결과,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이전 시점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도 남녀집단 모두 안정적으로 자기지연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검증을 통한 성별 비교 결과, 남학생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세 변인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복지 개입 방안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청소년통계」(여성가족부, 2023) 결과, 2023년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비록 전체 학생 비율의 3.2%로 적은 수치이나, 전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비하여, 다문화 학생 증가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임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의 정의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다수는 한국에서 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다문화청소년과 달리 하나 이상의 문화 및 언어와 이들의 삶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김진희 외, 2021), 두 문화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유승희, 2020).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사회적응의 어려움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Oetting and Beauvais(1991)의 직교문화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개인과 문화적 측면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낮은 문화정체성이 형성되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미한다. 반면, 개인과 문화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높은 문화정체성 및 높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사회적 적응 측면의 발달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보다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심리, 사회 및 문화적 발달 측면은 어느 한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 관계의 지속적인 과정(Oetting & Beauvais, 1991)을 통해 형성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단계에서 가장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 관계를 넘어 부모, 또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시기이다(Featherstone, 2010). 특히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기는 익숙한 6년간의 초등시기에서 벗어나는 시기임과 동시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송연주 외, 2015)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화가 큰 시기이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청소년 시기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외에도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경험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한국문화와 외국부모의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유승희, 2020). 이는 단순히 부모의 이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부정적인 편견과 경험(김지혜, 2017; 손혜숙, 2020) 정도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다(황희봉, 주은선, 2022; 유승희, 2020).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인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며(박동진, 김송미, 2023; 김지혜, 2019; Cano et al., 2015; Piña-Watson et al., 201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들의 학교적응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모상현, 2018; 김진영, 이유진, 2022).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인식을 뜻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장혜림, 이래혁, 2019; 김지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이연숙, 박종효, 2021; 김학재, 임중철, 2020).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또래 및 교사관계 및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김지혜, 2019; 전수정, 윤혜미,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유승희, 2020; 손한결, 신나나,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생애 첫 집단환경이자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학습활동을 하며, 본인과 동일한 연령 또래들과 경쟁과 우정을 경험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또래 아닌 다른 성인 어른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부분 학교요인을 결과요인으로만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소인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심리·문화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최근 종단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손한결, 신나나, 2020; 범령옥, 임선아, 2024; 이경상 외, 2018). 범령옥과 임선아(2024)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양방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이경상 외(2018)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서 한국인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성인기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학교 내 주요 관계 및 한국어 어려움인 학습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인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사회적 요인인 교사 및 또래관계, 학습활동을 의미하는 학교적응 요소가 다문화가정 중학생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적응은 매우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적응을 동시에 관계성을 검증함과 더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비다문화 청소년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김재엽 외, 2016;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성차 비교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은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시기는 심리사회 및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이소연, 2018; 박혜숙, 양상희, 2017; Michael Daly, 2022),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전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경험을 겪는 사춘기 시기며, 이 시기의 심리적 측면에서 유독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Birkeland et al., 2014; Mendle et al., 2019).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전환기가 포함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양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주요 세 요인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살핌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과 직결되는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모색하고자 위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은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과 상호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변인의 안정성과 상호영향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두 가지 문화에 적응해야 함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혜, 2019; 모상현, 2018; 김진영, 이유진, 2022; 박동진, 김송미, 2023).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토대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는데, 김지혜(2019)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광현과 강상경(2019)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반면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자아존중감이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수연(2009)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적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외 문헌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민 온 경험이 5년 미만의 히스패닉 아동, 청소년의 문화적 스트레스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상과 영향과 더불어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음으로 보고하였다(Cano et al., 2015).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이러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문화적 측면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소영, 홍세희, 2019; 김수미, 김현옥, 2022).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소영, 홍세희, 2019).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적응을 잘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소영, 홍세희, 2019; 봉초운 외, 2018). 이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문화적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연관성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며, 무엇보다 중학생 전 과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를 살핀 종단연구는 드물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전 과정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 시기는 전 생애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격한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발달과정으로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소이다(박미정, 유난숙, 2017).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관계 경험을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데(정득, 이종석, 2015), 청소년 시기에 여러 관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대표적 공간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만족감을 높임에 따라 긍정적 심리자원인 자아존중감과도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다(박선희, 2021; 김예 성, 김소영, 2023). 이는 학교 내에서의 낮은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도 연관됨을 뜻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박은민, 2010; 김학재, 임중철, 2020; Whitesell et al., 2009; Thijs & Verkuyten, 2017). 먼저 박은민(2010)은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관계(교사 및 또래 애착)보다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며, 김학재와 임중철(2020)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위축을 낮춰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또한 Whitesell et al.(2009)은 아메리칸 인디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와의 종단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궤적이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 반면 소수 연구이지만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 또한 존재함에 따라(김진미, 홍세영, 2019; 강부자 외, 201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연구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반대로 소수이지만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손병덕, 허계형, 2016; 신희건, 2015), 교우 및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보고하였다(김미경, 조규판, 2019; 이윤정,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 간의 높은 관련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되는 특수한 경험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기가 동반하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강화, 배은경, 2018).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한솔, 김규찬, 2023;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는 독특한 경험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높기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소수자로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노성향, 2020).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로 보고되는데, 먼저 Cokley & Chapman(2008)은 사회의 비주류집단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동기와 성취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진영과 이유진(2022)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족지지·교사지지·친구지지가 높을 경우, 학교적응을 보호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달리, 소수이지만 학교적응 요소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연구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김종국과 조아미(2008)는 새터민 청소년 중, 학교적응, 남한 친구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고, 정서지지 중 또래관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 연구는 아니지만, 이경상 외(2018)의 연구에서 대학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한국인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사회적 관계),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학습)을 느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세 변인 간의 높은 상호 관련성이 예측됨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둘러싼 심리, 사회, 문화적 요인 간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성별 차이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심리, 사회적응에 대한 개입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정익중, 이지언, 2011)에 따라, 생애 주기에서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고, 개인 간 발달격차가 높은 청소년 시기에서의 성별 차이는 살펴봐야 할 중요 요인이다. 그리고 중학교 시기는 새로운 환경으로 학교 전환기가 포함된 시기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은 기존연구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고, 심리,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별을 비교하여 보는 연구는 중요하다(이소연, 2018; 박혜숙, 양상희, 2017; Michael Daly, 2020). 먼저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의 연구를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Lerner and Galambos(1998)는 중학생 시기 성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보고 되었으나, 이러한 격차는 중학교 시기부터 이러한 격차는 중학교 시기부터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은석 외, 2014). 황은희와 강지숙(2012) 연구에서 중학생 남녀학생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학교성적이 좋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가족경제 상태가 좋고, 학교성적이 좋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측면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소연(2018)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발달궤적의 성별 차이 연구에서 여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부정적 영향력이 성별 비교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많이 손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소영, 2013).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측면을 성별에 차이를 살펴보면, 송순과 오선영(2014)은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교우들과 더 개방적 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주(2010)는 교사관계, 학습태도 등의 측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정선미, 조옥귀(2009)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적응에 대한 상호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며,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 1기)의 자료 중 중학생 시기인 4~6차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며, 학교 전환기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전체 학년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4~6차)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자료는 일반적으로 세 시점 이상을 연구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중학교 3년의 전체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자료 중 결측치(missing value)는 삭제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은 다문화가정 중학생 1,316명이다.
2. 연구 도구
가. 자아존중감
MAPS 1기에서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난숙과 오경자(1992)의 자아존중감 16문항 중 4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을 그대로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활용함에 따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최대우도를 통해 단일성분을 확인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자가척도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학생 4차 0.82, 5차 0.82, 6차 0.83, 여학생 4차 0.83, 5차 0.81, 6차 0.83이다.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MAPS 1기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노충래(2000)의 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한 홍진주(2004)의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성 요소를 보면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다. 구성 개념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문항인(⑩) 부정문항의 제외하고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됨에 따라 총 9문항을 활용하였다. 두 하위요인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활용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단일성분을 검증하였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학생 4차 0.83, 5차 0.86, 6차 0.87, 여학생 4차 0.83, 5차 0.83, 6차 0.81이다.
다. 학교적응
MAPS 1기에서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가 개발하고, 정화실(2009)이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의 학교적응 척도 중 학습활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마찬가지로 탐색적 요인 분석 실시 결과, 이중 학습활동(⑤), 교우관계(④)는 부정문항으로 요인 분석 결과치가 매우 낮아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변인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활용함에 따라 단일성분을 검증하였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교적응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학생 4차 0.90, 5차 0.90, 6차 0.89, 여학생 4차 0.89, 5차 0.88, 6차 0.88이다.
3. 연구 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이하 ARCL)을 통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변인의 안정성과 변인 간 상호영향을 확인하였다. ARCL은 t시점의 변수의 값이 t-1시점의 동일한 변인의 값을 통해 설명하는 모델로, 다변량 모델을 확장시켜 변인 간의 교차효과 또한 검증할 수 있게 한 모형으로(홍세희 외, 2007), 각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분석모델이다(Selig & Little, 2012). ARCL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순차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통해 모형 간 비교한다. 이후, 적합도 기준에 따라서 최종 모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을 제약 검증 후, 경로동일성 검증을 통해 시간 경과에도 유효한 결과인지를 확인 후,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하여, 오차항 간의 공변량 제약을 통해 총 16개 모형을 경쟁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중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였으며, 모형검증 비교표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적합도를 x2 차이검증과 TLI, CFI, RMSEA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x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한계로 인해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TLI, CFI, RMSEA를 고려하였다. 모형 적합도 해석 기준은 TLI, CFI은 값이 높을수록 좋은적합도를 의미하며, 0.9 이상부터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뜻하며,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그리고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비교에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CFI 기준으로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CFI 값이 0.01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두 모델의 동일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마지막으로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동일한 척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종단자료는 공변량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Pitts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가 체계적인 변량을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오차항끼리의 상관성을 가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박수원, 김샛별, 2016). 본 연구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세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AMOS 23.0을 사용하여 ARCL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49.2%, 여학생은 50.8%이다(표 1). 그리고 부모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 일본 34.4%, 필리핀 25.7%, 중국 및 조선족이 25.3% 순이며, 한국인은 3.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모 출신국과 반대로 부의 출신국가는 한국인이 96.5%로 대부분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의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부는 한국인, 모는 외국인임을 알 수 있다. 연간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800만 원 미만이 25.8%, 1,800만~2,400만 원 미만이 25.2%, 3,600만 원 초과는 14.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n=1,316) | |||
|---|---|---|---|
| 변수 | n | % | |
| 성별 | 남학생 | 648 | 49.2 |
| 여학생 | 668 | 50.8 | |
| 합계 | 1,316 | 100.0 | |
| 어머니 출신국가 | 한국 | 42 | 3.2 |
| 중국 및 조선족 | 333 | 25.3 | |
| 베트남 | 34 | 2.6 | |
| 필리핀 | 338 | 25.7 | |
| 일본 | 453 | 34.4 | |
| 태국 | 51 | 3.9 | |
| 기타 | 65 | 4.9 | |
| 합계 | 1,316 | 100.0 | |
| 아버지 출신국가 | 한국 | 1,210 | 96.5 |
| 기타 | 44 | 3.5 | |
| 합계 | 1,254 | 100.0 | |
| 가구소득 | ~1,800만 원 미만 | 337 | 25.8 |
| 1,800만~2,400만 원 미만 | 329 | 25.2 | |
| 2,400만~3,600만 원 이하 | 455 | 34.8 | |
| 3,600만 원 초과 | 186 | 14.2 | |
| 합계 | 1307 | 100.0 | |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에 대한 기술통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시점별 자아존중감의 3년간의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4차 3.38, 5차 3.36, 6차 3.30, 여학생은 4차 3.33, 5차 3.31, 6차 3.26으로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3년 평균추이는 남학생은 4차 1.17, 5차 1.22, 6차 1.21, 여학생은 4차 1.17, 5차 1.19, 6차 1.15로 평균점수의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적응 또한 남학생은 4차 3.08, 5차 3.05, 6차 3.06, 여학생은 4차 3.06, 5차 3.06, 6차 3.06으로 남녀 모두 학교적응 3년간의 평균추이가 유사하였다. 세 변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왜·첨도 결과, 왜도 값은 –0.52~2.18, 첨도 값은 –0.47~6.56 사이로, 왜도 ±3, 첨도 ±10 기준(Kline, 2005)을 두 집단 모두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남학생=648, 여학생=668) | ||||||||||
|---|---|---|---|---|---|---|---|---|---|---|
|
|
||||||||||
| 자아존중감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학교적응 | ||||||||
|
|
||||||||||
| 4차(중1) | 5차(중2) | 6차(중3) | 4차(중1) | 5차(중2) | 6차(중3) | 4차(중1) | 5차(중2) | 6차(중3) | ||
|
|
||||||||||
| 평균 | 남 | 3.38 | 3.36 | 3.30 | 1.17 | 1.22 | 1.21 | 3.08 | 3.05 | 3.06 |
| 여 | 3.33 | 3.31 | 3.26 | 1.17 | 1.19 | 1.15 | 3.06 | 3.06 | 3.06 | |
|
|
||||||||||
| 표준 편차 | 남 | 0.53 | 0.51 | 0.51 | 0.32 | 0.38 | 0.37 | 0.45 | 0.44 | 0.42 |
| 여 | 0.52 | 0.53 | 0.55 | 0.32 | 0.34 | 0.30 | 0.43 | 0.42 | 0.41 | |
|
|
||||||||||
| 왜도 | 남 | -0.52 | -0.25 | 0.03 | 1.98 | 1.74 | 2.18 | 0.01 | 0.29 | 0.10 |
| 여 | -0.24 | -0.27 | -0.47 | 2.06 | 1.98 | 2.12 | 0.14 | 0.07 | 0.02 | |
|
|
||||||||||
| 첨도 | 남 | 0.41 | -0.11 | -0.71 | 2.86 | 2.24 | 6.56 | 0.18 | -0.05 | 0.52 |
| 여 | -0.45 | -0.30 | 0.83 | 3.18 | 3.45 | 3.50 | -0.09 | 0.26 | 0.95 | |
|
|
||||||||||
| t 검증 | 1.86 | 1.90 | 1.49 | -0.11 | 1.72 | 3.162** | 0.79 | -0.68 | -0.051 |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세 잠재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남녀를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이변량 상관관계
| (남학생=648, 여학생=668) | |||||||||||
|---|---|---|---|---|---|---|---|---|---|---|---|
|
|
|||||||||||
| 시점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4차 (중1) | 1 | 자아존중감 | 1 | ||||||||
| 2 | 문화적응 스트레스 | -0.30 (-0.36) | 1 | ||||||||
| 3 | 학교적응 | 0.49 (0.55) | -0.29 (-0.31) | 1 | |||||||
|
|
|||||||||||
| 5차 (중2) | 4 | 자아존중감 | 0.48 (0.48) | -0.25 (-0.23) | 0.43 (0.31) | 1 | |||||
| 5 | 문화적응 스트레스 | -0.25 (-0.24) | 0.33 (0.33) | -0.23 (-0.19) | -0.41 (-0.30) | 1 | |||||
| 6 | 학교적응 | 0.38 (0.35) | -0.17 (-0.23) | 0.57 (0.53) | 0.54 (0.50) | -0.29 (-0.27) | 1 | ||||
|
|
|||||||||||
| 6차 (중3) | 7 | 자아존중감 | 0.42 (0.46) | -0.20 (-0.22) | 0.37 (0.32) | 0.49 (0.61) | -0.29 (-0.23) | 0.41 (0.43) | 1 | ||
| 8 | 문화적응 스트레스 | -0.26 (-0.19) | 0.31 (0.34) | -0.20 (-0.15) | -0.29 (-0.23) | 0.33 (0.33) | -0.25 (-0.23) | -0.29 (-0.22) | 1 | ||
| 9 | 학교적응 | 0.36 (0.38) | -0.18 (-0.23) | 0.52 (0.53) | 0.43 (0.41) | -0.24 (-0.21) | 0.61 (0.66) | 0.59 (0.55) | -0.27 (-0.24) | 1 | |
3.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기본 모형검증 및 분석 결과
ARCL 기본 모형검증을 먼저 수행하여,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3년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최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16개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비교 결과에서, 전체 모형 16개 중 모형 3개(모형2,7,16)의 △x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하지만 모형 16개의 △x2이 동일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의 △CFI 값이 0.01을 초과하지 않아 모형1~16까지 전체 모형이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형16을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4
전체 집단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기본 모형검증
| 모형 | x 2 | df | TLI | CFI | RMSEA | △x2 | △df | △CFI |
|---|---|---|---|---|---|---|---|---|
| 모형1 | 935.161 | 270 | .0.952 | 0.963 | 0.043 | - | - | |
| 모형2 | 947.152 | 274 | 0.952 | 0.962 | 0.043 | 11.991** | 4 | -0.001 |
| 모형3 | 949.295 | 278 | 0.953 | 0.963 | 0.043 | 2.143 | 4 | 0.001 |
| 모형4 | 955.873 | 282 | 0.953 | 0.962 | 0.043 | 6.578 | 4 | -0.001 |
| 모형5 | 956.781 | 283 | 0.953 | 0.962 | 0.043 | 0.908 | 1 | 0 |
| 모형6 | 958.242 | 284 | 0.953 | 0.962 | 0.042 | 1.461 | 1 | 0 |
| 모형7 | 963.094 | 285 | 0.953 | 0.962 | 0.043 | 4.852* | 1 | 0 |
| 모형8 | 963.948 | 286 | 0.954 | 0.962 | 0.042 | 0.854 | 1 | 0 |
| 모형9 | 964.11 | 287 | 0.954 | 0.962 | 0.042 | 0.162 | 1 | 0 |
| 모형10 | 964.767 | 288 | 0.954 | 0.962 | 0.042 | 0.657 | 1 | 0 |
| 모형11 | 967.536 | 289 | 0.954 | 0.962 | 0.042 | 2.769 | 1 | 0 |
| 모형12 | 968.311 | 290 | 0.954 | 0.962 | 0.042 | 0.775 | 1 | 0 |
| 모형13 | 974.07 | 292 | 0.954 | 0.962 | 0.042 | 5.759 | 2 | 0 |
| 모형14 | 975.539 | 292 | 0.954 | 0.962 | 0.042 | 1.469 | 0 | 0 |
| 모형15 | 976.559 | 293 | 0.954 | 0.962 | 0.042 | 1.02 | 1 | 0 |
| 모형16 | 987.137 | 294 | 0.954 | 0.961 | 0.042 | 10.578*** | 1 | -0.001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전체집단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자기지연 경로동일성 검증결과, 자아존중감(5차 β=0.429, 6차 β=0.435,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5차 β=0.317, 6차 β=0.332, p<.001), 학교적응(5차 β=0.632, 6차 β=0.680, p<.001) 모두 자기지연 경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전체집단의 교차지연 경로동일성 결과,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학교적응(5차 β=0.061, 6차 β=0.068,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과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부적영향이 확인되었다(5차 β=-0.103, 6차 β=0.102, p<0.01). 다음으로 이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경로에서 이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5차 β=-0.053, 6차 β=0.057, p<0.05)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이 있었으나 이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5차 β=-0.023, 6차 β =-0.027, p>0.05).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로에서,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은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5차 β=0.198, 6차 β=0.194, p<0.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확인하였다(5차 β=-0.113, 6차 β=-0.108, p<0.001).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상호 영향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또한 상호 영향관계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집단의 최종 모형(모형 16) 추정 결과
주: 굵은 실선은 유의미한 표준화 계수,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표 5
전체 집단의 최종 모형(모형16)의 경로계수 추정치
| 경로 | B | S.E. | C.R. | β | ||
|---|---|---|---|---|---|---|
|
|
||||||
| 4차 자아존중감 | → | 5차 자아존중감 | 0.435*** | 0.028 | 15.349 | 0.429 |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66** | 0.021 | -3.171 | -0.103 | |
| → | 5차 학교적응 | 0.046* | 0.02 | 2.329 | 0.061 | |
| 4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34*** | 0.029 | 11.732 | 0.317 |
| → | 5차 자아존중감 | -0.09* | 0.037 | -2.436 | -0.053 | |
| → | 5차 학교적응 | -0.029 | 0.026 | -1.145 | -0.023 | |
| 4차 학교적응 | → | 5차 학교적응 | 0.621*** | 0.028 | 21.921 | 0.632 |
| → | 5차 자아존중감 | 0.263*** | 0.039 | 6.665 | 0.198 | |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95*** | 0.029 | -3.267 | -0.113 | |
|
|
||||||
| 5차 자아존중감 | → | 6차 자아존중감 | 0.435*** | 0.028 | 15.349 | 0.435 |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66** | 0.021 | -3.171 | -0.102 | |
| → | 6차 학교적응 | 0.046* | 0.02 | 2.329 | 0.068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34*** | 0.029 | 11.732 | 0.332 |
| → | 6차 자아존중감 | -0.09* | 0.037 | -2.436 | -0.057 | |
| → | 6차 학교적응 | -0.029 | 0.026 | -1.145 | -0.027 | |
| 5차 학교적응 | → | 6차 학교적응 | 0.621*** | 0.028 | 21.921 | 0.68 |
| → | 6차 자아존중감 | 0.263*** | 0.039 | 6.665 | 0.194 | |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95*** | 0.029 | -3.267 | -0.108 | |
4.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모형검증 및 분석 결과
가. 성별에 따른 종단적 측정 모형 검증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모형16)을 통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남학생은 x2=644.473, TLI=0.953, CFI=0.961, RMSEA=0.043, 여학생은 x2=655.434, TLI=0.953, CFI=0.960, RMSEA=0.043으로 최종 모형 적합도가 두 집단 모두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 검증
| 모형 | x 2 | df | TLI | CFI | RMSEA |
|---|---|---|---|---|---|
| 남학생 | 644.473 | 294 | 0.953 | 0.961 | 0.043 |
| 여학생 | 655.434 | 294 | 0.953 | 0.960 | 0.043 |
최적의 연구 모형을 찾고자 앞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모형1부터 모형16까지 차례대로 비교하였고,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표 7>의 내용과 같이 남녀 모두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모형2, 3, 4), 자기회귀계수 동일성(모형5, 6, 7), 교차회귀계수 동일성(모형8~13), 오차공분산의 동일화 제약(모형14~16)을 지속적으로 가해도 적합도 지수가 이전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CFI 값이 0.01 이하임에 따라 동일성이 성립되었다(Cheung & Rensvold,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집단 모형검증에서의 최적 모형(모형16)을 선정하였다.
표 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모형검증
| 모형 | x 2 | df | TLI | CFI | RMSEA | △x2 | △df | △CFI |
|---|---|---|---|---|---|---|---|---|
| 모형1 | 1307.088 | 582 | 0.951 | 0.960 | 0.031 | - | - | - |
| 모형2 | 1319.092 | 586 | 0.951 | 0.959 | 0.031 | 12.004 | 4 | -0.001 |
| 모형3 | 1320.795 | 590 | 0.952 | 0.959 | 0.031 | 1.703 | 4 | 0 |
| 모형4 | 1328.283 | 594 | 0.952 | 0.959 | 0.031 | 7.488 | 4 | 0 |
| 모형5 | 1329.325 | 595 | 0.952 | 0.959 | 0.031 | 1.042 | 1 | 0 |
| 모형6 | 1330.914 | 596 | 0.952 | 0.959 | 0.031 | 1.589 | 1 | 0 |
| 모형7 | 1336.602 | 597 | 0.952 | 0.959 | 0.031 | 5.688 | 1 | 0 |
| 모형8 | 1337.663 | 598 | 0.952 | 0.959 | 0.031 | 1.061 | 1 | 0 |
| 모형9 | 1337.699 | 599 | 0.952 | 0.959 | 0.031 | 0.036 | 1 | 0 |
| 모형10 | 1338.144 | 600 | 0.952 | 0.959 | 0.031 | 0.445 | 1 | 0 |
| 모형11 | 1339.855 | 601 | 0.952 | 0.959 | 0.031 | 1.711 | 1 | 0 |
| 모형12 | 1340.991 | 602 | 0.952 | 0.959 | 0.031 | 1.136 | 1 | 0 |
| 모형13 | 1347.423 | 604 | 0.952 | 0.959 | 0.031 | 6.432 | 2 | 0 |
| 모형14 | 1347.475 | 604 | 0.952 | 0.959 | 0.031 | 0.052 | 0 | 0 |
| 모형15 | 1348.427 | 605 | 0.952 | 0.959 | 0.031 | 0.952 | 1 | 0 |
| 모형16 | 1359.892 | 606 | 0.951 | 0.958 | 0.031 | 11.465 | 1 | -0.001 |
<표 8>, [그림 2]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분석한 최종 경로계수이다. 먼저 자기지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기인 자아존중감 경로동일성에 남학생(5차 β=0.293, 6차 β=0.279, p<.001), 여학생(5차 β=0.542, 6차 β=0.56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남학생(5차 β=0.283, 6차 β=0.301, p<.001), 여학생(5차 β=0.356, 6차 β=0.366, p<.001)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교적응 또한 남학생(5차 β=0.618, 6차 β=0.646, p<.001), 여학생(5차 β=0.645, 6차 β=0.705, p<.001) 모두 자기지연 경로동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남녀 두 집단 모두 자기지연 경로동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주요 세 변인의 남녀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세 변인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자기지연 결과값(β)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최종 모형(모형 16) 추정 결과
주: 실선이 유의미한 표준화 값이며,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표준화 값.
*p<.05, **p<.01, ***p<.001.
표 8
성별에 따른 최종 모형(모형16) 경로계수 비교
| 경로 | 남학생 | 여학생 | ||||||||
|---|---|---|---|---|---|---|---|---|---|---|
| B | S.E. | C.R. | β | B | S.E. | C.R. | β | |||
| 4차 자아 존중감 | → | 5차 자아존중감 | 0.28*** | 0.04 | 6.962 | 0.293 | 0.576*** | 0.04 | 14.459 | 0.542 |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88** | 0.032 | -2.75 | -0.132 | -0.053* | 0.026 | -2.035 | -0.089 | |
| → | 5차 학교적응 | 0.065* | 0.027 | 2.383 | 0.092 | 0.032 | 0.028 | 1.142 | 0.041 | |
| 4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322*** | 0.043 | 7.483 | 0.283 | 0.355*** | 0.039 | 9.203 | 0.356 |
| → | 5차 자아존중감 | -0.144** | 0.05 | -2.867 | -0.088 | -0.046 | 0.054 | -0.845 | -0.026 | |
| → | 5차 학교적응 | -0.016 | 0.034 | -0.461 | -0.013 | -0.044 | 0.039 | -1.136 | -0.034 | |
| 4차 학교적응 | → | 5차 학교적응 | 0.597*** | 0.039 | 15.258 | 0.618 | 0.636*** | 0.04 | 15.762 | 0.645 |
| → | 5차 자아존중감 | 0.409*** | 0.057 | 7.179 | 0.312 | 0.133** | 0.054 | 2.433 | 0.1 | |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12** | 0.045 | -2.665 | -0.131 | -0.065 | 0.036 | -1.78 | -0.086 | |
| 5차 자아 존중감 | → | 6차 자아존중감 | 0.28*** | 0.04 | 6.962 | 0.279 | 0.576*** | 0.04 | 14.459 | 0.569 |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088** | 0.032 | -2.75 | -0.118 | -0.053* | 0.026 | -2.035 | -0.097 | |
| → | 6차 학교적응 | 0.065* | 0.027 | 2.383 | 0.095 | 0.032 | 0.028 | 1.142 | 0.048 | |
| 5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322*** | 0.043 | 7.483 | 0.301 | 0.355*** | 0.039 | 9.203 | 0.366 |
| → | 6차 자아존중감 | -0.144** | 0.05 | -2.867 | -0.1 | -0.046 | 0.054 | -0.845 | -0.026 | |
| → | 6차 학교적응 | -0.016 | 0.034 | -0.461 | -0.016 | -0.044 | 0.039 | -1.136 | -0.037 | |
| 5차 학교적응 | → | 6차 학교적응 | 0.597*** | 0.039 | 15.258 | 0.646 | 0.636*** | 0.04 | 15.762 | 0.705 |
| → | 6차 자아존중감 | 0.409*** | 0.057 | 7.179 | 0.3 | 0.133** | 0.054 | 2.433 | 0.097 | |
| → |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 -0.12** | 0.045 | -2.665 | -0.118 | -0.065 | 0.036 | -1.78 | -0.087 | |
다음으로 세 변인 간의 교차지연계수를 통해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두 집단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이 있었다(남학생 5차 β=–0.132, 6차 β=–0.118, p<0.01 / 여학생 5차 β= –0.089, 6차 β=-.097, p<0.05). 또한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β 5차 0.312, 6차 β=0.3, p<0.001/여학생 5차 β=0.1, 6차 β=0.097, p<0.01).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녀집단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두 집단 간 경로 차이를 살펴보면,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학교적응 경로에서 남학생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으나(5차 β=0.092, 6차 β=0.095, p<0.05), 여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5차 β =0.041, 6차 β=0.048, p>0.05). 그리고 이전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도 남학생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확인됐으나(5차 β=–0.088, 6차 β=0.1, p<0.01), 여학생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5차 β =-0.026, 6차 β=-0.026, p>0.05).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로에서 남학생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확인됐으나(5차 β=–0.131, 6차 β=-0.118, p<0.01), 여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5차 β=-0.086, 6차 β=-0.087, p>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중학생 남녀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또한 이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중학생 남녀의 자아존중감이 향상시키는 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심리·문화·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상호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지속성과 변인 간 종단 관계와 이를 성별에 따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사회적 차원의 지원모색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첫째, <연구 문제 1> 전체 집단의 세 잠재변인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자기지연 및 교차지연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종단적 안정성인 자기지연 효과는 세 잠재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전 학년기에 세 변인 모두 학년의 변화가 있음에도 세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 잠재변인 간의 교차관계를 통해 상호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시점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진미, 홍세영, 2019; 김학재, 임중철, 2020)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연구(한광현, 강상경, 2019; 김소영, 홍세희, 2019; 봉초운 외, 2018)를 지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후시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응적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반면, 학교적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용순 외, 2012; 김지혜, 2019; 한광현, 강상경, 2019)을 지지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지혜, 2019; 김진영과 이유진, 2022)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이 이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은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되는 원인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미경, 조규판, 2019; 손병덕, 허계형, 2016; 신희건, 2015)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김종국, 조아미, 2008; 이경상 외, 2018).
둘째, <연구 문제 2>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시간의 흐름에도 자기지연 및 교차지연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지연 결과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세 잠재변인 간의 교차지연 결과를 통해 상호 영향관계 연구 결과, 먼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시점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학생 모두 높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김소영, 홍세희, 2019; 봉초운 외, 2018)를 지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녀학생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박은민, 2010; 김학재, 임중철, 2020)를 지지하나,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김진미, 홍세영, 2019; 강부자 외, 2012)를 지지하며, 성별에 따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후시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이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이 있으나,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여학생은 이전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반면, 학교적응 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김지혜, 2019; 한광현, 강상경,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인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지혜, 2019; 김한솔, 김규찬, 2023; 홍진승, 이영선, 202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이 이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로 결과, 남학생은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이 있었고,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부적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학생은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녀모두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김미경, 조규판, 2019; 손병덕, 허계형, 2016; 신희건, 2015)를 지지하는 바이나, 학교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김종국, 조아미, 2008; 이상균 외, 2012)에는 남학생 결과는 일치하나 여학생 결과는 일치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이 각각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이전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다음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 초기시점에 면담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스크리닝을 토대로 개인별 이중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개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변인 각각도 마찬가지로, 한 시점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을 조절하여 다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심리, 사회, 문화적 측면 개입시점을 중학교 1학년 학령 전환기 초기시점에서 개입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양방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심리, 사회, 문화적 측면이 서로 연관됨에 따라 지원 측면에서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문화적 요인에서의 부적응 측면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발전가능성, 사회관계를 하는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점의 심리,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아존중 감을 및 학교적응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인 맞춤별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남녀 학생의 차이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양방향적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양방향 상호관계는 검증되지 않고,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시점의 학교적응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문화가정 여자 중학생 경우, 우선적 개입 차원에서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일상생 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손상인 자아존중감에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소영, 2013). 따라서 학교라는 일상적 환경에서의 적응이 여학생들의 추후 심리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학교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적응에는 학습, 또래, 교사관계가 포함됨에 따라 학습적 지원 및 관계적 차원까지 단계적으로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교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개인 맞춤별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와 거리가 있는 외부기관임에 따라 학교 내의 사정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 따라 학교 내에서 지원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Oczlo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 분위기는 이민자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허용하는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 사회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시기는 정체성 형성 시기임에 따라 사회(타인)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학교 및 사회분위기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Thijs and Verkuyten(2017)은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내의 교육환경을 세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는데, 문화다양성 교육,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학급 및 학교 차원에서의 다인종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중 문화다양성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사업팀을 두어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교육 또한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Banks의 문화정체성 발달 측면에서 이러한 일회성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문화교육이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배경, 심리적 수준에 따라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모색하는 미시적 지원부터 학교 차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거시적 지원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둘러싼 심리, 문화,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며, 세 관계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에 따라 중학교 시기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심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학교 시기의 심리, 사회, 문화적 발달 측면을 살펴봄에 따라 다양한 배경요인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MAPS 1기 자료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학교 3학년까지만 조사하였다는 데이터 수집 한계에 따라, 문화정체성이 형성 및 완료되는 후기 청소년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선도할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서 인식의 전환 또한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이 필요하다.
부록
부표 1
전체 집단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기본 모형검증
| 모형 | x 2 | df | TLI | CFI | RMSEA | △x2 | △df | △CFI |
|---|---|---|---|---|---|---|---|---|
| 모형1 | 1083.14 | 369 | 0.947 | 0.96 | 0.038 | - | - | - |
| 모형2 | 1095.092 | 373 | 0.947 | 0.96 | 0.038 | 11.952 | 4 | 0 |
| 모형3 | 1097.207 | 377 | 0.948 | 0.96 | 0.038 | 2.115 | 4 | 0 |
| 모형4 | 1103.849 | 381 | 0.948 | 0.96 | 0.038 | 6.642 | 4 | 0 |
| 모형5 | 1104.747 | 382 | 0.948 | 0.96 | 0.038 | 0.898 | 1 | 0 |
| 모형6 | 1105.944 | 383 | 0.948 | 0.96 | 0.038 | 1.197 | 1 | 0 |
| 모형7 | 1110.859 | 384 | 0.948 | 0.96 | 0.038 | 4.915 | 1 | 0 |
| 모형8 | 1111.515 | 385 | 0.948 | 0.96 | 0.038 | 0.656 | 1 | 0 |
| 모형9 | 1111.672 | 386 | 0.948 | 0.96 | 0.038 | 0.157 | 1 | 0 |
| 모형10 | 1112.398 | 387 | 0.948 | 0.96 | 0.038 | 0.726 | 1 | 0 |
| 모형11 | 1115.056 | 388 | 0.949 | 0.96 | 0.038 | 2.658 | 1 | 0 |
| 모형12 | 1115.82 | 389 | 0.949 | 0.96 | 0.038 | 0.764 | 1 | 0 |
| 모형13 | 1121.683 | 391 | 0.949 | 0.96 | 0.038 | 5.863 | 2 | 0 |
| 모형14 | 1152.951 | 392 | 0.947 | 0.958 | 0.038 | 31.268 | 1 | -0.002 |
| 모형15 | 1212.315 | 394 | 0.943 | 0.955 | 0.04 | 59.364 | 2 | -0.003 |
| 모형16 | 1224.544 | 396 | 0.943 | 0.954 | 0.04 | 12.229 | 2 | -0.001 |
부표 2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모형검증
| 모형 | x 2 | df | TLI | CFI | RMSEA | △x2 | △df | △CFI |
|---|---|---|---|---|---|---|---|---|
| 모형1 | 1567.706 | 783 | 0.945 | 0.957 | 0.028 | - | - | - |
| 모형2 | 1579.084 | 787 | 0.945 | 0.956 | 0.028 | 11.378 | 4 | -0.001 |
| 모형3 | 1580.759 | 791 | 0.945 | 0.956 | 0.028 | 1.675 | 4 | 0 |
| 모형4 | 1588.337 | 795 | 0.945 | 0.956 | 0.028 | 7.578 | 4 | 0 |
| 모형5 | 1589.359 | 796 | 0.945 | 0.956 | 0.028 | 1.022 | 1 | 0 |
| 모형6 | 1590.59 | 797 | 0.945 | 0.956 | 0.028 | 1.231 | 1 | 0 |
| 모형7 | 1596.483 | 798 | 0.945 | 0.956 | 0.028 | 5.893 | 1 | 0 |
| 모형8 | 1597.323 | 799 | 0.945 | 0.956 | 0.028 | 0.84 | 1 | 0 |
| 모형9 | 1597.337 | 800 | 0.945 | 0.956 | 0.028 | 0.014 | 1 | 0 |
| 모형10 | 1597.84 | 801 | 0.946 | 0.956 | 0.028 | 0.503 | 1 | 0 |
| 모형11 | 1599.362 | 802 | 0.946 | 0.956 | 0.028 | 1.522 | 1 | 0 |
| 모형12 | 1600.513 | 803 | 0.946 | 0.956 | 0.027 | 1.151 | 1 | 0 |
| 모형13 | 1607.102 | 805 | 0.945 | 0.956 | 0.028 | 6.589 | 2 | 0 |
| 모형14 | 1637.661 | 806 | 0.944 | 0.954 | 0.028 | 30.559 | 1 | -0.002 |
| 모형15 | 1694.419 | 808 | 0.94 | 0.951 | 0.029 | 56.758 | 2 | -0.003 |
| 모형16 | 1706.983 | 810 | 0.939 | 0.95 | 0.029 | 12.564 | 2 | -0.001 |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4-30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6-11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7-03

- 1719Download
- 5348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