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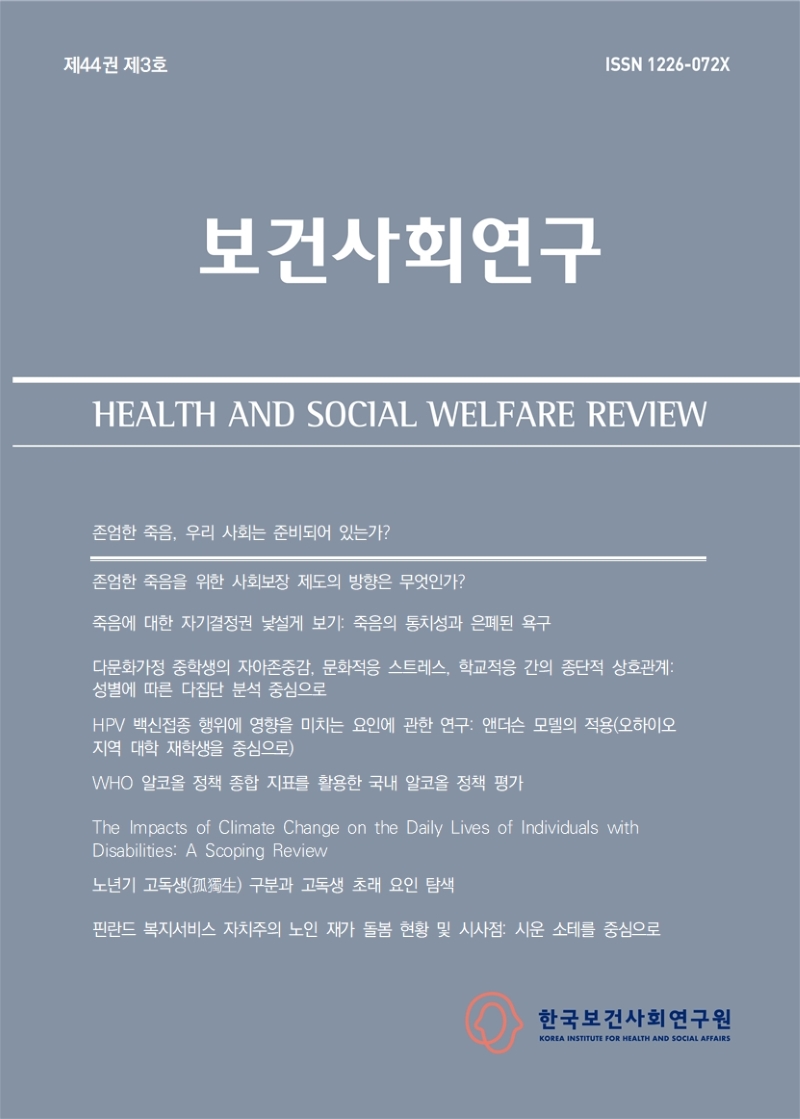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 이산선택실험
Patient Preferences for the Primary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Koo, Bon Mi1; Do, Young Kyung2*
보건사회연구, Vol.44, No.3, pp.451-469,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3.45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환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그들의 선호와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환자의 선호 파악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사업참여를 결정할 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할 때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둘 다 가진 환자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전적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은 환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반면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은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진료 시간의 길이 자체는 환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한다.
Abstract
The growing social cost burden of chronic diseases in South Korea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s. However, patient preferences for these programs have remained largely unexplored. We conducted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 to systematically evaluate patient preferences for the Primary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atient interviews, we identified 5 attributes and 14 levels to develop a DC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7 choice sets. Our study population comprised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in their 40s and 50s. A conditional logit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sonalized in-person consultation, personalized remote consultation, monetary incentives, and out-of-pocket costs significantly influence patient preferences, while the length of consultation time does not. Patients with both hypertension and diabetes placed higher values on personalized in-person and remote services compared to the two groups with hypertension only or diabetes on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monetary incentive was substantial, even greater than that for in-person and remote services.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inform policies aimed at better designing the primary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이산선택실험 연구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환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주요 속성 5개와 수준 14개를 도출하고, 17개의 선택조합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40~50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각 속 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다. 추정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속성은 대면 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본인 부담금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비대면 서비스보 다 더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둘 다 있는 환자군은 각각 한 질환만 있는 환자군에 비해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불 의사금액은 상당한 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설계에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Ⅰ. 서론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큰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79.6%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며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5%를 차지하였다(질병관리청 2022, p. 8).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김희선 외, 2018, p. 108).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고혈압·당뇨병을 중심으로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 이전에는 「심뇌혈관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2007)」,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2016)」 등을 시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하고 보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a, p. 6). 이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케어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팀 협력을 통해 환자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에 개정된 4차 개정안에서는 참여율에 따라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하고,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23a).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건강관리 행동을 실천하거나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3b). 시범사업 4년여 만인 2024년 8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대상 환자의 폭넓은 참여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중 의사들은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보고하였고(조비룡 외, 2020, p. 61), 환자들도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로 이미 긍정적인 치료적 협력관계에 있는 의사의 권유로 참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환자의 참여 거절은 의사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Vahdat et al., 2014, p. 4), 또는 의사가 설명한 시범사업 특성이 환자의 필요나 상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Fraenkel & McGraw, 2007, p. 536). 또한 사업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다(이경수 외, 2019, p. 8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선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대부분 환자의 경험을 고찰하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권유림 외, 2018; 박미경 외, 2021; 주정민 외, 2017; 황정해 외, 2020). 질적연구는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업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사업 참여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참여를 거절한 환자들의 의견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둘째, 사업의 속성이 변하거나 추가되면 이러한 변화가 환자의 참여 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 방법론은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을 제공한다. DCE를 방법론으로 활용한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인의 근무 기관 선호도(Abdel-All et al., 2019; Rockers et al., 2012), 대중 또는 환자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선호 연구(Cheraghi-Sohi, et al., 2008; Giles et al., 2015; Moor et al., 2022; Ozdemir et al., 2023; Veldwijk et al., 2013), 간호사의 의료기관 선호(고유경 외, 2018),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료서비스 또는 정책에 대한 선호(권솔 2021; 김대중 외, 2022; 임민경, 배은영 2009; Lee & Bae, 2017)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DCE는 사업의 속성과 수준을 고려한 응답자의 선택을 기반으로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Kleij et al., 2017, p. 2)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잠재적 대상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다양한 속성과 수준을 조합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택을 분석함으로써 응답자의 참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DCE는 만성질환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Moor et al.,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주요 속성을 기반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선호를 DCE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 4차 개정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환자 인센티브 제공 및 비대면 환자 관리 강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러한 사업의 속성들이 환자의 선호와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 및 고혈압,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DCE를 이용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조기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참여가 저조한 40~50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속성이 이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Ⅱ.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측면은 이 연구의 주제 영역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만성질환자의 일차의료 이용 경험과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경험을 연구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여 일차의료기관 선택 요인, 시범사업의 참여 동기 및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측면은 이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환자의 선호 파악을 위한 이산선택실험 연구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1.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의료 이용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경험 연구
만성질환자들은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종합병원보다 일차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이순영, 2016, p. 70)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김정연 2015, p. 222). 일차의료기관 선택의 주된 이유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접근성과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상담받을 수 있는 포괄성이었다(이진용 외 2016, p. 82; Kim & Lee, 2024, p. 4).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평생 치료와 자가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상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개인차가 나타났다(이정섭 외, 2000, p. 1226).
우리나라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된 질적연구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권유림 외, 2018), 지역사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박미경 외, 202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황정해 외, 2020)에서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참여 경험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인적 수준에서 만성질환관리의 어려움은 관련 사업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 관련 사업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 의사의 권유, 전문가의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결정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권유림 외, 2018, pp. 239-240; 박미경 외, 2021, p. 523),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박미경 외, 2021, p. 523)도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ICT를 활용한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도 참여 요인이 되었다(권유림 외, 2018, p. 239).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의 목적, 서비스 내용, 비용 부담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황정해 외, 2020, p. 60). 일차의료에서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마다 제한점이 있지만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기존 진료와 달리 의사 관심의 증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의사-환자 관계 향상,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2. 환자의 선호 파악을 위한 이산선택실험 연구
개인의 선호는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와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로 구분된다. 현시 선호는 실제 행동으로 관찰되는 선호이며, 진술 선호는 가상의 상황에 제시된 여러 대안 중 응답자의 선택을 통해 표현한 선호이다(김준기, 김호정, 2008, p. 138). DCE는 이러한 진술 선호를 기반으로 한다. Lancaster의 소비자 선택 이론과 확률 효용 이론을 토대로 발전된 DCE는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속성 조합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속성 수준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을 변화시키며, 이런 개인의 선택 변화는 확률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이해한다(Lancaster, 1966, Kleij et al., 2017, p. 2에서 재인용).
DCE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주로 의료전문가의 직장 선호(고유경 외, 2018; Abdel-All et al., 2019; Kolstad, 2011; Kruk et al., 2010; Rockers et al., 2012) 또는 보건의료정책 관련 선호(임민경, 배은영, 2009; Lee & Bae, 2017), 일반인의 보건의료정책(유한욱, 조창익, 2016),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선호(권솔 2021; 김대중 외, 2022; Cheraghi-Sohi et al., 2008; Moor et al., 2022; Ozdemir et al., 2023)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일차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중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받고 싶은 일차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때 일차의료기관의 속성으로는 방문 진료 제공 여부, 거리, 대기 시간, 진료의 신속성, 진료하는 의사의 수, 운영시간, 의료시설 수준 등이 포함되고, 의료진의 특성으로는 전문성, 환자에 대한 지식, 진료 과정, 환자 중심성,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등을 제시하고 환자 또는 대중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Caldow et al., 2007; Cheraghi-Sohi et al., 2008; Gerard et al., 2012; Krinke et al., 2019; Moor et al., 2022). 이와 같은 연구는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일차의료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Kleij et al.(2017)은 일차의료 관련 DCE 연구에 대해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적용된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조, 과정, 결과 속성으로 구분하고, 가장 선호된 속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자주 적용된 구조적 속성은 “예약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으며, 과정 속성에서는 “함께하는 의사결정/환자의 의견에 대한 의사의 관심”, 그리고 결과 속성에서는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는 일차의료 과정과 관련된 속성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의료 선호 연구에서 항상 구조, 과정, 결과 속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 목적에 따라 일차의료 속성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와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기대효과와 본인부담금(out-of-pocket cost), 인센티브 등 서비스 관련 속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를 분석하였다(김대중 외, 2022; 박문수 외, 2016; Giles et al., 2015; Molema et al., 2019; Ozdemir et al., 2023; Veldwijk et al., 2013). Ozdemir et al.(2023)의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새로운 일차의료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유형을 진료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실천 또는 건강행동 개입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환자의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iles et al., 2015; Molema et al., 2019; Veldwijk et al., 2013). Giles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적은 금액의 인센티브(low-value incentive)를 현금(cash) 또는 쇼핑 바우처(shopping voucher)의 형태로 적합한 대상자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사업 내용이 세분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이미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전반의 사업에 대한 선호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DCE 방법이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DCE의 장점 중 하나는 아직 현재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또는 포함될 예정인 속성을 추가하여 응답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Ryan, et al. 2012, p.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안과 본사업 시행 계획에서 포함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강화된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속성을 추가하여 응답자의 선호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이산선택실험 설계
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과 수준 결정
이산선택실험(DCE)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attribute)과 수준(level)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속성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선호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뜻하며, 수준은 각 속성 내에서의 차이를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연구(권유림 외, 2018; 박미경 외, 2021; 황정해 외, 2020; Giles et al., 2015; Kleij et al., 2017; Molema 2019; Ozdemir et al., 2023; Veldwijk et al., 2013)를 고찰하고 또한 저자들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연구의 일환인 질적 종단연구의 결과 일부(도영경, 구본미, 2025)를 참고하여, 속성의 잠정적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 단계의 목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속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최대한 누락 없이,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데 있었다. 이 단계의 결과로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세부 서비스 내용보다는 서비스 유형, 진료 시간, 본인부담금, 검사비 지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심이 많으며, 또한 이 요인들이 사업 참여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일대일 면접을 시행하여 DCE에 포함할 속성을 도출하고 각 속성별 수준의 범위(range)와 증분(increment)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이 일대일 면접 대상은 질환, 연령,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8명의 참여자는 고혈압 환자 5명, 당뇨병 환자 3명이었고,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으며, 40~50대 4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직접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대상자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파악한 요인 중에서 면접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결과와 일관되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 내의 세부 서비스 내용보다는 대면 또는 비대면과 같은 서비스 유형, 진료 시간, 본인부담금, 검사비 지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속성별 수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먼저 개인 맞춤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면접 대상자들이 구체적인 세부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공 여부로만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전화 또는 문자 서비스와 같은 세부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는 데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일부 환자에서 긍정적인 선호 요인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넓게 보아서는 본인부담금 크기 아래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속성에 대해서는 3분, 5분, 10분의 수준을,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 속성에 대해서는 방문당 최대 10,000원 이내의 수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는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검토를 기반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면접 내용에 대한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속성과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검사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의 감소로도 흡수될 수 있다는 점, 금전적 인센티브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별도의 속성으로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요인이며 따라서 환자들 역시 실질적인 경험이 부재할 것이므로, 금액 수준보다는 최대 액수를 속성 설명으로 표시하되 지급 여부를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 속성은 0원에서 10,000원까지로 충분한 수준 범위를 확보하였고, 3,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2,000원의 증분을 유지하고, 최대 10,000원이 되도록 수준을 정하였다.
이상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결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속성 5개와 수준 14개를 도출하였다. 5개 속성은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이었고, 각 속성별 세부 수준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택에 관한 이산선택실험의 속성과 수준
| 속성 | 수준 |
|---|---|
|
|
|
|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 3분 |
| 5분 | |
| 10분 | |
|
|
|
|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질환 관리,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연간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제공 |
|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없음(기존과 같은 진료) | |
|
|
|
|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전화, 문자, 모바일 앱 사용하여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상담) |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 |
|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없음(기존과 같은 진료) | |
|
|
|
| 개인 참여율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원까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없음 | |
|
|
|
|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 | 0원 (추가 비용 없음) |
| 방문당 3,000원 | |
| 방문당 5,000원 | |
| 방문당 7,000원 | |
| 방문당 10,000원 | |
나. 설문지 개발
관련 속성과 그 수준이 결정되면, 속성과 수준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가상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택조합(choice set)을 구성해야 한다. <표 1>에 기술한 5개 속성과 14개의 수준을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대안(alternative)은 총 120개이다(=3×2×2×2×5).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대안으로 구성된 선택조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조합은 총 7,140개이다(=(120×119)/2). 하지만 모든 선택조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것(full factorial design)은 불가능하므로, DCE에서는 응답 가능한 규모의 선택조합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fractional factorial design). 본 연구에서는 Sawtooth Software SMART 4.0.2를 이용하여, DCE 선택조합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였다(Ryan et al., 2012, p. 17). 세 가지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시되는 각 속성은 서로 상관관계를 최소화해야 한다(orthogonality), (2) 각 속성의 수준을 비슷한 빈도로 제시한다(level balance), (3) 선택조합에 함께 제시되는 두 개의 시나리오는 동일한 속성을 갖지 않도록 반복을 최소화해야 한다(minimum overlap). Sawtooth Software SMART 4.0.2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총 15개의 선택조합을 선정하고, d-efficiency를 높이기 위해 10개 버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10개 버전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설문조사 시작 전에 조사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시하였으며, 2개의 예비 문항을 DCE 본 조사 앞에 배치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DCE 설문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문항(warm-up question)과 응답의 합리성(rationality)과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이다(Mangham et al., 2009, Ryan et al., 2012, p. 28에서 재인용). 따라서 DCE 설문 문항은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2개의 예비 문항은 최종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DCE 문항과 일반적 특성 6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DCE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변환하여 점검 및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DCE 설문 문항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DCE 질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참가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문 내용과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문 문항의 가독성과 응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대상자의 포함 기준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40~59세 성인 남녀로,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근거한다. 첫째, 40대 이상 중년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들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 연령층이 향후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주요 대상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온라인 패널 조사의 특성상 60대 이상의 참여율이 낮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정도의 인지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4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한국리서치에서 구축한 패널 마스터 샘플(Master Sample)을 활용하였다. 이 응답자 풀은 지역, 성, 연령, 학력, 소득 등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패널로 약 93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5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질환별 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의 DC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0일간 이루어졌다.
3. 분석 모형 및 방법
DCE에서 개인의 선택은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관측불가능한 확률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개인 i에게 j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효용은 관측가능한 속성인 확정적 요소(deterministic component; Vij)와 관측불가능한 확률적 요소(random component: εij)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확률적 요소는 속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과 개인 수준의 임의적 변이를 의미하며 오차항으로 표현된다. 응답자 i가 j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부터 얻는 효용(utility, Uij)은 다음과 같이 각 속성 벡터와 오차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 i가 j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k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신 선택한다는 것은 j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효용이 k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효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응답자 i가 j의원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오차항의 분포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로짓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β값을 활용하여 각 의원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속성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Ryan et al., 2012). 특히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의 추정 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속성 각각과의 맞교환(trade-off)을 계산할 수 있는데, 각 속성의 맞교환을 의미하는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은 아래 식과 같이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의 계수(β5)와 각 수준의 계수(βx)의 비(ratio)에 음수를 취하여 산출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둘 다 있는 응답자가 159명이었고, 고혈압만 있는 사람이 131명, 당뇨병만 있는 사람이 110명이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있는 집단은 남성, 50대의 더 비율이 높아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7.8%였고,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위해 동네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6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혈압만 있는 환자의 경우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73.3%로, 당뇨병만 있거나 고혈압·당뇨병 둘 다 있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단위: 명 (%) | |||||||||
|---|---|---|---|---|---|---|---|---|---|
| 전체 | 고혈압만 있는 사람 | 당뇨병만 있는 사람 | 고혈압·당뇨병 둘 다 있는 사람 | ||||||
| 성별 | 남 | 200 | (50.0) | 46 | (35.1) | 53 | (48.2) | 101 | (63.5) |
| 여 | 200 | (50.0) | 85 | (64.9) | 57 | (51.8) | 58 | (36.5) | |
| 연령 | 40대 | 200 | (50.0) | 72 | (55.0) | 67 | (60.9) | 61 | (38.4) |
| 50대 | 200 | (50.0) | 59 | (45.0) | 43 | (39.1) | 98 | (61.6) | |
| 고혈압, 당뇨병 외의 만성질환 | 있음 | 151 | (37.8) | 40 | (30.5) | 40 | (36.4) | 71 | (44.7) |
| 없음 | 249 | (62.3) | 91 | (69.5) | 70 | (63.6) | 88 | (55.3) | |
| 주관적 건강 상태 | 매우 나쁘다 | 6 | (1.5) | 1 | (0.8) | 3 | (2.7) | 2 | (1.3) |
| 나쁜 편이다 | 98 | (24.5) | 25 | (19.1) | 24 | (21.8) | 49 | (30.8) | |
| 보통이다 | 203 | (50.8) | 64 | (48.9) | 59 | (53.6) | 80 | (50.3) | |
| 좋은 편이다 | 82 | (20.5) | 37 | (28.2) | 21 | (19.1) | 24 | (15.1) | |
| 매우 좋다 | 11 | (2.8) | 4 | (3.1) | 3 | (2.7) | 4 | (2.5) | |
| 진료 받는 의료 기관 | 동네의원 | 265 | (66.3) | 96 | (73.3) | 67 | (60.9) | 102 | (64.2) |
| 2차 병원 | 61 | (15.3) | 17 | (13.0) | 15 | (13.6) | 29 | (18.2) | |
| 3차 종합병원 | 69 | (17.3) | 15 | (11.5) | 27 | (24.5) | 27 | (17.0) | |
| 기타 | 5 | ( 1.3) | 3 | ( 2.3) | 1 | ( 0.9) | 1 | ( 0.6) | |
| 전체 | 400 | (100.0) | 131 | (100.0) | 110 | (100.0) | 159 | (100.0) | |
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 선호
<표 3>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속성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조건부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속성은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환자가 내야 하는 추가 본인부담금이다. 통계적 유의성과 계수의 부호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대면 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지급은 응답자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높을수록 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의 진료 시간은 응답자의 사업 참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응답자를 질환 유형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세 집단 모두, 대면 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은 사업 참여 확률을 증가시키는 속성이었고, 본인부담금은 사업 참여 확률을 감소시키는 속성이었다.
표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택의 조건부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전체 (400명) | 고혈압만 있는 사람 (131명) | 당뇨병만 있는 사람 (110명) | 고혈압·당뇨병 둘 다 있는 사람 (159명) | |||||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 속성 | ||||||||
|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제공(ref. 미제공) | .5317*** | .0315 | .5130*** | .0548 | .5735*** | .0618 | .5246*** | .0492 |
|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ref. 미제공) | .3781*** | .0324 | .4055*** | .0570 | .3455*** | .0633 | .3763*** | .0506 |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ref. 미지급) | .9075*** | .0330 | .8500*** | .0574 | 1.0468*** | .0653 | .8647*** | .0515 |
|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5분(ref: 3분) | .0825 | .0436 | .1303 | .0763 | .0710 | .0850 | .0532 | .0683 |
|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10분 (ref: 3분) | .0817 | .0441 | .1303 | .0773 | .0621 | .0876 | .0592 | .0690 |
| 추가 비용(천 원) | -.1712*** | .0065 | -.1789*** | .0115 | -.1783*** | .0129 | -.1618*** | .0101 |
| 상수항 | -.0238 | .0333 | .0354 | .0586 | -.0163 | .0652 | -.0779 | .0518 |
| Log likelihood | -3162.3349 | -1037.7304 | -840.67356 | -1277.3077 | ||||
| Likelihood ratio X2 | 1993.10 | 648.61 | 606.04 | 751.70 | ||||
| Pseudo R2 | 0.2396 | 0.2381 | 0.2649 | 0.2274 | ||||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표 4>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각 속성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제시한다. 지불의사금액은 각 속성을 얻기 위해 응답자가 의원을 방문할 때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비용으로서, 응답자가 부여하는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추정 결과로부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106원을,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는 2,208원을 더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응답자는 기본 진료비 외에 약 5,301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이 대면 서비스 제공이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의 진료 시간 증가는 미미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지불의사금액 결과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네 가지의 속성 중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응답자가 진술하는 선호에 가장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질환별 세 집단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각 집단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의 크기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순이었다. 각 속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당뇨병만 있는 집단에서 5,87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집단(5,344원) 순이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집단에서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집단은 당뇨병만 있는 환자에 비해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데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도를 더 높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속성 수준별 지불의사금액
| 전체 (400명) | 고혈압만 있는 사람 (131명) | 당뇨병만 있는 사람 (110명) | 고혈압·당뇨병 둘 다 있는 사람 (159명) | |||||
|---|---|---|---|---|---|---|---|---|
| 추정치 | 95% 신뢰구간 | 추정치 | 95% 신뢰구간 | 추정치 | 95% 신뢰구간 | 추정치 | 95% 신뢰구간 | |
|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제공 (ref. 미제공) | 3,106 | (2,702, 3,509) | 2,868 | (2,206, 3,528) | 3,216 | (2,450, 3,982) | 3,242 | (2,566, 3,918) |
|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 (ref. 미제공) | 2,208 | (1,826, 2,591) | 2,267 | (1,622, 2,910) | 1,938 | (1,231, 2,644) | 2,326 | (1,691, 2,961) |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ref. 미지급) | 5,301 | (4,829, 5,773) | 4,751 | (3,995, 5,505) | 5,871 | (4,951, 6,789) | 5,344 | (4,554, 6,133) |
|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5분 (ref: 3분) | 482 | (-18, 982) | 728 | (-109, 1,565) | 398 | (-539, 1,335) | 329 | (-500, 1,158) |
| 의사의 평균 진료 시간 10분 (ref: 3분) | 477 | (-30, 984) | 728 | (-122, 1,578) | 348 | (-603, 1,300) | 366 | (-472, 1,204)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CE를 이용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분석한 연구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40~50대 응답자들에게서,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은 높을수록 사업 참여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불의사금액으로 표현하면, 대면 서비스 제공은 약 3,100원으로 나타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의 약 2,200원보다도 높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대면 서비스 제공이나 비대면 서비스 제공보다도 지불의사금액의 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약 5,300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 혹은 당뇨병만 있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기존 문헌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40~50대 만성질환자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Veldwijk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할 때 일대일의 개별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만성질환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가 비대면 서비스보다 대면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더 낮고(Bergmo & Wangberg, 2007),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Chua et al., 2022). 이는 환자들이 의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하는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며,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Bergmo & Wangberg, 2007). 이 연구의 결과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대면 서비스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기는 하였지만, 고혈압만 있는 환자군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환자군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응답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두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들이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 만성질환자들이 개별화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혈압만 가진 집단은 당뇨병이 있는 두 집단에 비해 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질환의 복잡성과 관리의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4차 개정안)에서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내용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증 고혈압 환자가 선호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복합 질환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에게는 더 집중적이고 개별화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환자에게는 그들의 특성과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효과도 증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관련된 금전적 요인이 응답자의 사업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먼저 본인부담금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Giles et al., 2015; Ozdemir et al., 2023; Veldwijk et al., 2013).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역시 사업 참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가능한 조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 아래(Wanders et al., 2014), 금전적 유인은 사업 참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경제적 유인과 건강행동 실천 또는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Giles et al., 2015; Molema et al., 2019).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금전적 유인 제공의 효과가 예방접종 또는 건강검진과 같은 간단한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만, 생활개선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Giles et al., 2015; Voigt, 2012). 심지어 금전적 유인 제공이 오히려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Wanders et al., 2014). 또한 금전적 유인이 참여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Gneezy et al.,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결과는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사업 참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 쓰일 수는 있으나, 이 결과 자체로 금전적인 유인과 역유인에 대한 규범적인 처방까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Molema et al.(2019)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 참여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 전제조건, 유인의 유형, 유인의 제공 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차의료 현장에서 현금성 유인 제공의 실질적 효과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의사의 진료 시간 자체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독립된 물리적 진료 시간의 연장 자체는 환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저자들이 이 연구 이전에 수행해 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질적연구(도영경, 구본미, 2025)에서도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진료 시간 연장이 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강점은 먼저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국내 기존 연구들은 이미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화가 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선호를 조사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DCE를 적용하여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강점은 40~50대 연령층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령층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집중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의 선호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추가적인 연구의 강점으로는, 질적연구에 기반하여 도출된 속성의 타당성, 본사업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적시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을 일련의 단계를 통하여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DCE 방법론을 통하여 계량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실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불 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를 밝힘으로써 본사업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불의사금액이 방문당 약 2,000~3,000원인 것으로 추정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참여 확대 노력에서 강조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본인부담금이 갖는 잠재적 사업 참여 저해 효과는 특히 경제적 취약집단 환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금 증가가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DCE의 특성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제공하는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속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해가 사업의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설문조사 시작 전에 사업 안내문을 제시하고 선택조합 질문 문항에서도 사업의 속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속성의 의미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응답자들이 이해한 내용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둘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선호가 조사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 경험과 이용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외에 이러한 특성에 따른 잠재적 차이를 사전 연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한 층화 분석을 사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층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40~59세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고령자가 다수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체 대상자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넷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구집단 대표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웠으며,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인구집단 수준의 통계라기보다는 주어진 표본과 모형에 기반한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성과 수준 도출의 타당성, 응답자의 인지적 역량과 답변의 성실성, 진술 선호와 실제 선호 사이의 잠재적 괴리 등과 같은 DCE 수행에 따르는 일반적인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여러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할 때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용 외에도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는 두 가지 금전적 요인이 갖는 상반된 방향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 선호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설계에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References
. (2023b).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고혈압 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금 받아가세요.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act=view&list_no=1479514&tag=&nPage=22
. (2022).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만성질환 Fact book.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b_list=9&act=view&list_no=145880&nPage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16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09-25

- 3419Download
- 3684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