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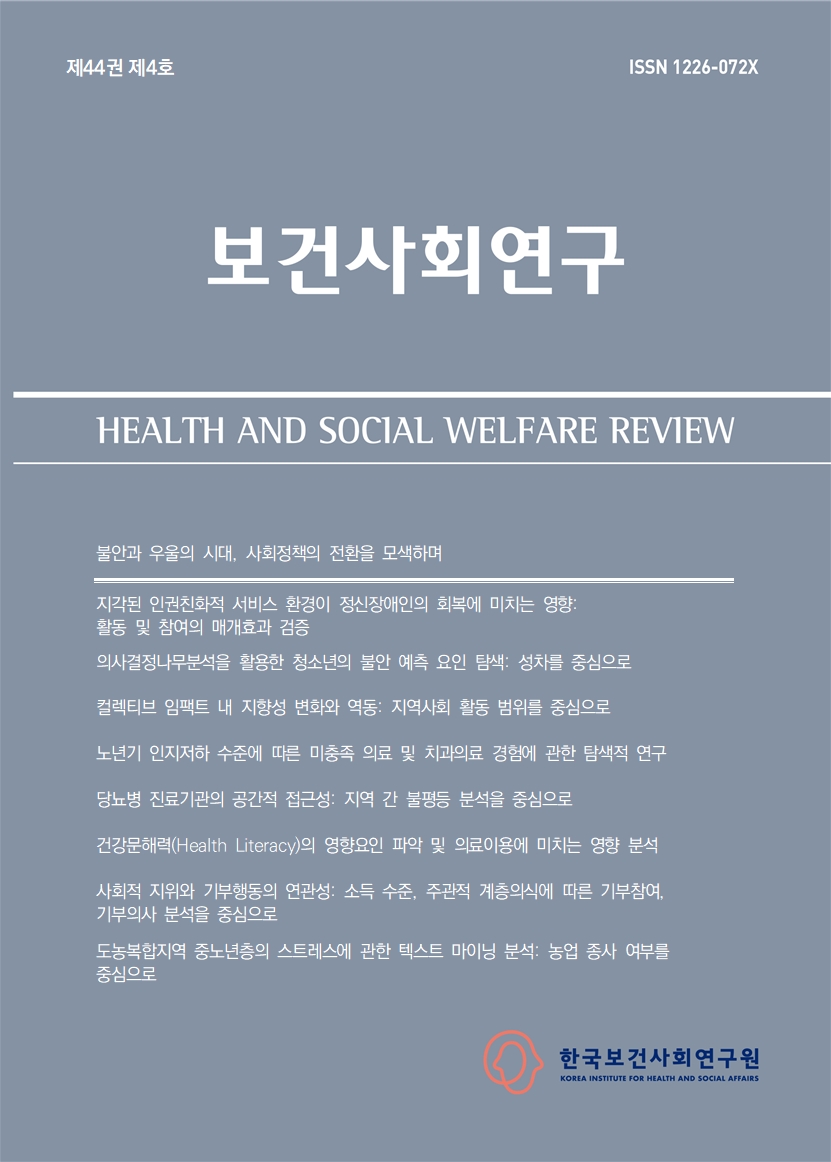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사회적 지위와 기부행동의 연관성: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기부참여, 기부의사 분석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Donation Behavior: Focusing on Analysis of Donation Participation and Donation Intention
Tak, Hyeonsam1*
보건사회연구, Vol.44, No.4, pp.151-173, December 2024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151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이 연구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소득 수준, 교육 수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주관적 계층의식)가 개개인의 기부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첫째,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의사를 보이고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할 때 기부활동에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셋째, 가구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을 때 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넷째, 위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일부 국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섯째, MZ 세대의 기부의사와 기부참여는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단순히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은 이들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수준이 낮아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 때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확한 국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관측치들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한 다층모형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Donation is a prosocial behavior of giving one’s income and assets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serving as an important measure of a society’s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This paper explores how objective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influence donation behavior, categorizing donation behavior into four groups: (1) the indifferent group, which is not interested in donating, (2) the simple intention group, which has the intention to donate but has not taken action, (3) the temporary participation group, which donates but has no future plans to continue, and (4) the active participation group, which actively plans and participates in donations. For the analysis, the 2023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was used. The results of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being in the active participation group was highest when income level and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were at their peak. Additionally, even among low-income households with a monthly income of less than 1 million won (USD 750), the likelihood of expressing interest in or participating in donations increased as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rose. The study’s findings, which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socioeconomic status,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ng in donation behavior, differ from some western studies like Piff et al. (2010). Furthermore, the analysis found that residing in a metropolitan area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donation intention and participation, and that the baby boom generation had higher donation participation and intention compared to the MZ generation. These results remained robust even after introducing various demographic and social control variables.
초록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소득과 재화를 내어주는 친사회적 행위로 한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본 논문은 기부행동을 크게 기부에 관심이 없는 (1) 무관심 집단, 기부를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만 참여의사는 있는 (2) 단순 의향 집단, 기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3) 일시적 참여집단, 적극적으로 기부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4) 적극적 참여집단으로 나누어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기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 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항로짓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높을 때 적극적 참여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기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할 확률이 높아졌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기부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본 연구의 결과는 Piff et al.(2010)과 같은 일부 국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기부참여와 기부의사가 MZ 세대에 비해 높았다. 위의 결과는 다양한 인구·사회 통제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이 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하다. 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2007년 대비 3.3p% 증가한 11.7%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크게 치우진 한국의 특성상 2020년대 이후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생애 소득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계층의 벽이 만들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이러한 상황에 마침표를 찍었다.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팬데믹에 취약한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위기를 맞는 등 위기 때일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기부를 들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면 기부는 단순히 자신의 재화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자산의 재분배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시켜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기부행위는 단순히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넘어 사회 공동체의 신뢰,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하며 행위자와 수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편창훈(2021)의 연구는 기부, 자원봉사를 비롯한 나눔 행동이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Andreoni(1990)가 제안한, 나눔을 통해 정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온광효과(warm glow effect)는 한국 사회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부 행위의 동기는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적 동기를 기부행위의 동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는 단면적으로 볼 때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행위이기에 이러한 접근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Siemens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엄격(tight culture)하고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서는(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기부의 동인은 사회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Reimer(2023)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의 기부는 사회적 규범과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기부가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 지위와 이에 따른 기대되는 역할이 다소 규범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기부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연구인 김자영, 김두섭(2013)이 개인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 때 기부 횟수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의 대표적 변수인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부 국외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내의 연구와 달리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낮을수록 타인의 복지와 필요에 더 민감하여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가령 Piff et al.(2010)에 따르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사회적 연결망, 유대감을 바탕으로 고소득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은 상위 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위 계층에 비해 이타적 행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Piff et al., 2010; Piff & Moskowitz, 2017). 국내 연구와 Piff et al.(2010) 등의 연구 결과의 차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기부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내적 동기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iff & Moskowitz,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집중하였다. 정확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모든 변수를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인구·사회 변인을 모두 포함한 모형을 모두 추정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기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사회 변인과 기부
기부를 비롯한 ‘나눔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이 제시되고 있다(강철희 외, 2012a; 권재기, 2021). 주목할 점은 종속변수 설정을 기부 참여와 같은 이항변수로 설정하는지, 기부 금액과 같은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여성일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지만, 남성은 기부 금액이 더 높다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표 1>에 연구자들이 활용한 종속변수를 정리하였다.
표 1
선행연구 정리(사회적 지위와 기부행동)
| 연구자 | 연도 | 연구 내용 요약 | 활용데이터, 종속변수 |
|---|---|---|---|
| ■ 국내 연구 1. 전반적으로 기부와 소득의 정(+)적 관계 보고 | |||
| 홍은진 | 2005 |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선적 기부금액의 규모가 더 커짐 | |
| 강철희 외 | 2012a | 소득 수준은 기부와 관련된 나눔행동과 정적 관계 | |
| 강철희 외 | 2012b | 가구소득과 기부노력은 정적 관계(기부노력에 대한 OLS 분석)를 보였으나, 기부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소득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 강철희 외 | 2016 |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금융자산이 자선적 기부 규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하지만 자산 대비 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낮아졌음. | |
| 김자영, 김두섭 | 2013 |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기부 횟수가 증가 | |
| 박정훈, 이상무 | 2024 | 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 증가 | |
| 노법래, 김소영 | 2019 | 계층의식은 기부행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나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기부행위 강도는 낮아졌음. | |
| 양성욱 | 2018 |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 | |
| 조경환, 강소랑 | 2019 | 경제적 요인들은 모두 기부 금액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음. 하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는 가처분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보임. | |
| 한다이, 김석은 | 2015 | 가구소득은 자원봉사활동 횟수에는 부적인 영향을, 기부금액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
| 강철희 외 | 2021 | 가구소득은 기부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또한, 소득이 상승 이동한 경우 기부참여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하강 이동한 경우 기부참여 확률이 감소. | |
| ■ 국내 연구 2. 일부 소득과 기부의 부(-)적 관계, 관계 없음을 보고 | |||
| 강철희 외 | 2019 | 가구소득과 총 기부노력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세속적 기부노력은 가구소득과 역 U자 형태를 보였음 | |
| 황창순, 강철희 | 2002 | 가구소득은 기부노력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개인소득은 부적 관계를 보임 | |
| 강철희 외 | 2011 | 저소득층의 기부 참여율이 절대적으로 낮으며 기부 규모 역시 미약하나 경제 수준 대비 기부 규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
| ◆ 국외 연구 1. 소득과 기부의 정(+)적 관계 보고 | |||
| Morgan et al. | 1977 | 소득과 기부 금액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 | |
| Schervish & Havens | 1995 | 소득 수준은 기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침 | |
| ◆ 국외 연구 2. 소득&계층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기부, 친사회적 행동의 부(-)적 관계 보고 | |||
| Wiepking | 2007 | 소득이 기부 여부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득과 소득 대비 기부 비율(총 기부 및 종교적 기부) 간에는 일관된 부정적 관계가 확인.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음. | |
| Kraus & Keltner | 2009 | 하층 계층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이 참여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임. 특히 기부와 같은 이타적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연구 결과, 자원 의존성과 권력에 대한 분석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참가자들은 비참여적 신호를 더 많이 보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참가자들은 참여적 신호를 더 많이 보임. | |
| Keltner et al. | 2014 | “공공재 게임”과 같은 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타인과 나누는 방식을 관찰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 또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제적 게임과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하거나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측정. 하층 계층의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안녕에 더 민감하게 반응. | |
| Varnum et al. | 2015 | 이 연구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신경적 공감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겪는 얼굴을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P2 신경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상층 계층보다 더 강한 신경적 공감 반응을 보여, 이는 하층 계층이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 | |
| Piff & Moskowitz | 2017 |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인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동정심에서도 나타나며, 하위 사회 계층 출신의 사람들이 상위 계층 사람들보다 더 쉽게 동정심을 느끼고, 나눔, 돌봄, 도움과 같은 동정심에 기반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음. |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계층과 공감능력의 연관성 리뷰 |
| Piff & Robinson | 2017 |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 계층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설명. | 기존의 사회 계층과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문헌들을 종합하여 리뷰 |
| Piff et al. | 2010 |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타인의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타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음. 구체적으로 낮은 계층이 상위 계층에 비해 1) 타인에게 자원을 더 분배했고, 2)관대한 기부 태도를 보였으며 3)신뢰도가 높고 4)더 많은 도움 행동을 보였음. | |
| ◆ 기타 국외 연구 | |||
| Côté et al. | 2015 | 경제적 불평등이 큰 미국의 주에서는 상위 소득층이 하위 소득층보다 덜 관대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불평등이 적은 주에서는 상위 소득층이 오히려 더 관대하게 행동. | |
| Vieite. Yan et al. | 2022 | 사회적 계층에 따라 기부 선호가 다르게 나타남. 하층 계층은 긴급한 필요(기아 해결)에 기부하는 반면, 상층 계층은 비긴급한 원인을 선호 | |
| Von Hermanni & Tutić | 2019 | 계층과 이타적 행동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예상과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더 이타적인 행동을 보였음. | |
| Suss | 2023 | 사회적 압력, 사회적 불평등 인식 강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큰 지역에서 상위 소득 계층이 기부를 더 많이 하였음을 보고 | |
또한 기부는 ‘나눔행동’의 범주 중 하나로써 다른 나눔행동인 자원봉사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연구자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특히 주목한다(강철희 외, 2012a; 강철희 외, 2017; 권재기, 2021). 일반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는 서로 상충되는 경쟁적 관계이며 둘 중 한 가지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의 시점과 기부와 자원봉사를 보완 관계가 있는 정적인 관계로 간주하는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의 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완적 관계의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강철희 외, 2012a). 강철희 외(2012a)가 언급한 소비 모델을 인용하자면,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impure altruist)인 개인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편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 행동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위와 기부의 연관성 탐구 1 –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이론, Bourdieu(1986)의 자본유형 이론을 중심으로 본 높은 사회적 계층의 기부 동인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가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다. 앞서 언급한 Andreoni(1990)의 연구에서 밝혀낸 기부의 주 동기인,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의 일환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광효과 이외에도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위신(prestige) 역시 기부의 큰 동기이기에 이러한 탐구는 타당하다고 하겠다(Wuthnow, 1991).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령 소득이 높아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낮을 수 있고 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둘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Veehoven, 2002; 최수빈, 최성언, 2024). 하지만 소득과 교육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계층의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Jackman & Jackman, 1973; Lungberg & Kristenson, 2008; 김자영,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은 설령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기부행위와 같은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큰 영향을 발휘한다. 실제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개인의 행동과 정서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derson et al, 2015; Adler et al,. 2000).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개인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러한 집단 정체성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Keefer et al., 2015). 이 때, 개인의 계층 정체성을 통한 집단 정체성 형성은 계층 집단과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개인과 개인의 행동을 정의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Keefer et al., 2015; Smit, 2019). 사회정체성 이론을 창시한 헨리 타즈펠(Henry Tajfel)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과 집단적 소속감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Tajfel, 1978). 즉, 개개인의 특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도 집단이 규정하는 규범의 영역에서 보면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특정 사회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경향성, 즉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의 경향성이 있다. 가령 ‘나는 한국 사회에서 저 사람과 달리 상위 계층에 속한다’와 같이 자기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활성화는 소속 집단의 전형적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탈개인화 자기 범주화(depersonalized self categoriz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이인태, 2019),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변수를 일종의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자신을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동기, 관점을 동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로 변화시켜 집단행동을 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Haslam et al., 2000). 사회행태주의 관점을 창시한 미드(Mead) 역시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규정하는 지배적 원리와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Mead, 1934; 이성록, 2003; 김자영, 김두섭, 2013)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 뒤르켐(Durkheim) 또한 개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며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Durkheim, 1951). 특히,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를 띠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구성원들은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규범과 책임을 동기로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하지만 단순히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높은 사회적 계층이라는 집단에서 작동하는 규범에 따라 기부에 참여한다’고 결론짓기엔 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며 집단적 규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위 계층의 기부 동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작동하는 집단적 규범을 설명하기 위해 부르디외(Bourdieu)의 ‘자본 유형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를 장(field)이 모인 구조화된 공간으로 간주하였는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본의 양 및 구조에 따라 고유성을 가진 일련의 장이 형성된다(Bourdieu, 1986). 자본은 자본을 보유한 행위자의 자리매김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며, 보유한 자본에 따라 각각의 장별로 다른 양상을 띠는 삶의 형태는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에 기여한다(김해인, 2022). 이 때 사회를 이루는 장의 구조는 자본(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자본이 단일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장(field)에서 다른 유형의 자본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즉, 각 유형의 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위 계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령, 대표적인 문화적 자본인 교육 수준은 단순한 문화적 자본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또한 경제적 자본을 투입하여 학력(문화적 자본)을 얻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동기 역시 강력하다. 이처럼 자본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계급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기부행동은 어떤 유형의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까? 기부를 통해 얻는 보상은 경제적 자본보다는 사회적 자본과 상징적 자본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기부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규범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도덕적 인정와 신뢰를 얻으며, 사회적 명예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Brown & Ferris, 2007; Suss, 2023). 따라서, 단편적으로 볼 때 경제적 자본의 손실인 기부 행위는 사회적, 상징적 자본의 보상이라는 동기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이론과 부르디외의 자본유형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기부는 특정 계층에서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를 준수하려는 행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 그 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위협받는다. 특정 계층에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 즉 규범을 경제적 자본을 제외한 다른 자본, 가령 사회적 자본과 상징적 자본의 양으로 간주한다면, 상위 계층에 속하는 개인은 해당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자본(기부를 통해 얻는 사회적 위신, 평판 등)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할 때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실패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규범이 강력한 사회라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부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3. 사회적 지위와 기부의 연관성 탐구 2 – 감정적 요인,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본 낮은 사회적 계층의 기부 동인: Piff et al.(2010)의 연구를 비롯한 국외 연구에 집중하여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소득, 교육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의 크기가 커질 때 기부 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표 1>의 ‘◆국외 연구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계층과 다르게 공감능력, 연민을 바탕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인 사람들이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Wiepking, 2007; 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Keltner et al., 2014; Piff & Robinson, 2017). 이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이 도출한 분석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표 1>에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 수준과 같은 본 연구가 주목한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와 기부행동의 연관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 때, 교육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부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강철희 외, 2021).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일반적으로 기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경희, 김지윤, 2017; 김자영, 김두섭, 2013). 하지만 소득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기부에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부적 관계를 보고한 일부 국외 연구가 존재한다(강철희 외, 2016).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조사한 소득과 기부 행동의 관계와 국외, 특히 일부 서양 연구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 연구자인 강철희 외(2019), 황창순, 강철희(2002) 역시 기부노력과 소득의 부(-)적 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하지만 강철희 외(2019), 황창순, 강철희(2002)의 연구는 일관된 소득과 기부 행동의 부(-)적 관계를 보고 하지 않고, 소득 변수를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하였거나(황창순, 강철희, 2002), 기부노력을 총 기부노력(소득과 부적 관계)과 세속적 기부노력(소득과 역 U자 형태)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강철희 외, 2019) 소득과 기부의 일관된 부(-)적인 관계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Piff et al.(2010)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초점을 맞추어 기부행동을 연구하지는 않았기에 Piff et al.(2010)의 연구와 본 연구, 국내 연구가 도출한 결론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탐구의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진, 2005; 김자영, 김두섭, 2013; 박정훈, 이상무, 2024; 노법래, 김소영, 2019; 양성욱, 2018; 고경환 외, 2018; 강철희 외, 2012a). 하지만 일부 국외 연구자들은 사회적 연결망, 유대감을 바탕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에 비해 기부에 더 참여하거나, 고소득층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Wiepking, 2007; 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Keltner et al., 2014; Piff & Robinson, 2017). 특히 Piff et al.(2010), Piff & Moskowitz(2017)의 연구는 상위 계층(upper class)의 경우 자기 자신의 성공, 부와 같은 내적 목표(internal, self oriented focus)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위 계층(lower class)의 경우 외부, 타인 지향적(external, other oriented focus)인 가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 연구인 최수빈, 최성언(2024)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이타적 행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신뢰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신 연구인 Von Hermanni & Tutić(2022), Suss(2023)의 경우 기존의 연구인 Côté et al.(2015)의 연구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위기가 고소득자, 상위 계층의 이타적 행위를 이끌어낸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활용 데이터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2023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한 관측치는 응답에 성실하게 참여한 표본 중 가구주 표본만을 추출하여 총 15,268명이다.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완한 조사이다. 2023년에는 ‘복지/사회참여/문화와여가/소득과소비/노동’ 부문에 초점을 둔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조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볼 기부 참여와 기부 의사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2>는 종속변수인 기부참여 유형에 따른 기술통계량이다.
표 2
기부유형(무관심 집단, 단순 의향 집단, 일시적 참여 집단, 적극적 참여 집단)에 따른 기술통계량
| 구분 | 무관심 집단 (N=8,377) | 단순 의향 집단 (N=2,708) | 일시적 참여집단 (N=711) | 적극적 참여 집단 (N=3,472) | |
|---|---|---|---|---|---|
| 계층의식 | 하층 | 3,688 (44.03%) | 871 (32.16%) | 179 (25.18%) | 712 (20.51%) |
| 중층 | 4,536 (54.15%) | 1,759 (64.96%) | 512 (72.01%) | 2,543 (73.24%) | |
| 상층 | 153 (1.83%) | 78 (2.88%) | 20 (2.81%) | 217 (6.25%) | |
| 가구소득 | 100만 원 미만 | 1,295 (15.46%) | 182 (6.72%) | 47 (6.61%) | 126 (3.63%) |
| 100만~200만 원 | 1,464 (17.48%) | 348 (12.85%) | 82 (11.53%) | 313 (9.01%) | |
| 200만~300만 원 | 1,833 (21.88%) | 529 (19.53%) | 116 (16.32%) | 513 (14.78%) | |
| 300만~400만 원 | 1,365 (16.29%) | 472 (17.43%) | 127 (17.86%) | 513 (14.78%) | |
| 400만~500만 원 | 875 (10.45%) | 374 (13.81%) | 93 (13.08%) | 512 (14.75%) | |
| 500만~600만 원 | 639 (7.63%) | 313 (11.56%) | 80 (11.25%) | 446 (12.85%) | |
| 600만~700만 원 | 329 (3.93%) | 166 (6.13%) | 42 (5.91%) | 275 (7.92%) | |
| 700만~800만 원 | 203 (2.42%) | 118 (4.36%) | 43 (6.05%) | 260 (7.49%) | |
| 800만 원 이상 | 374 (4.46%) | 206 (7.61%) | 81 (11.39%) | 514 (14.80%) | |
| 교육 수준 | 받지 않음 | 105 (1.25%) | 7 (0.26%) | 3 (0.42%) | 5 (0.14%) |
| 초등학교 | 785 (9.37%) | 96 (3.55%) | 43 (6.05%) | 85 (2.45%) | |
| 중학교 | 962 (11.48%) | 174 (6.43%) | 57 (8.02%) | 131 (3.77%) | |
| 고등학교 | 3,069 (36.64%) | 964 (35.60%) | 191 (26.86%) | 874 (25.17%) | |
| 대학교(4년제 미만) | 1,324 (15.81%) | 565 (20.86%) | 122 (17.16%) | 605 (17.43%) | |
| 대학교(4년제 이상) | 1,876 (22.39%) | 718 (26.51%) | 225 (31.65%) | 1,217 (35.05%) | |
| 대학원 석사과정 | 192 (2.29%) | 146 (5.39%) | 53 (7.45%) | 401 (11.55%) | |
| 대학원 박사과정 | 64 (0.76%) | 38 (1.40%) | 17 (2.39%) | 154 (4.44%) | |
| 자원봉사참여 여부 | 참여하지 않음 | 8,100 (96.69%) | 2,454 (90.62%) | 607 (85.37%) | 2,463 (70.94%) |
| 참여함 | 277 (3.31%) | 254 (9.38%) | 104 (14.63%) | 1,009 (29.06%) | |
| 세대 | 베이비 붐 세대 | 3,437 (41.03%) | 852 (31.46%) | 268 (37.69%) | 1,097 (31.60%) |
| X세대 | 2,528 (30.18%) | 1,045 (38.59%) | 234 (32.91%) | 1,522 (43.84%) | |
| M세대 | 1,783 (21.28%) | 651 (24.04%) | 179 (25.18%) | 739 (21.28%) | |
| Z세대 | 629 (7.51%) | 160 (5.91%) | 30 (4.22%) | 114 (3.28%) | |
| 신뢰수준 | 2.5271 (0.6416) | 2.6211 (0.6424) | 2.5414 (0.6697) | 2.6886 (0.6310) | |
| 주관적 만족감 | 3.2157 (0.9199) | 3.4375 (0.9266) | 3.4782 (0.9113) | 3.6716 (0.8936) | |
| 행정구역 | 수도권 외 기타지역 | 6,217 (74.22%) | 1,880 (69.42%) | 499 (70.18%) | 2,497 (71.92%) |
| 수도권 | 2,160 (25.78%) | 828 (30.58%) | 212 (29.82%) | 975 (28.08%) |
2. 변수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 행동 유형은 ‘기부 참여 여부(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와 ‘향후 기부 참여 의사 여부(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두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세부적으로 기부 참여 경험과 기부 의사가 없는 무관심 집단(1), 기부 참여 경험은 없지만 기부 의사는 있는 단순 의향 집단(2),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향후 기부 의사는 없는 일시적 참여집단(3), 기부에 참여하였고 기부 의사도 있는 적극적 참여집단(4)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변수(귀 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와 교육 수준(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변수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1=하층, 2=중층, 3=상층으로 역코딩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나눔 행동의 보완적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여부를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사회조사의 원 자료에는 1번 문항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 2번 문항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1=자원봉사 참여하지 않음, 2=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 처리하였다. 기타 인구사회 요인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작적 정의 및 변수 측정방식
| 조작적 정의 | 변수 | 측정 방식 |
|---|---|---|
| 기부행동 | 기부행동 | 1=무관심 집단 (기부 참여 경험과 향후 기부의사 없음) 2=단순 의향 집단 (기부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기부의사 있음) 3=일시적 참여집단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향후 기부의사는 없음) 4=적극적 참여집단 (기부에 참여하였고 향후 기부의사 있음) |
| 객관적 사회적 지위 | 소득 | 1=100만 원 미만, 2=100만~200만 원 미만, 3=200만~300만 원 미만, 4=300만~400만 원 미만, 5=400만~500만 원 미만, 6=500만~600만 원 미만, 7=600만~700만 원 미만, 8=700만~800만 원 미만, 9=800만 원 이상 |
| 교육 수준 | 0=받지 않음,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과정, 7=대학원 박사과정 | |
| 주관적 사회적 지위 | 주관적 계층의식 | 1=하, 2=중, 3=상 |
|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동 여부 | 1=참여하지 않음, 2=참여함 |
| 인구사회 요인 | 성별 | 1=남성, 2=여성 |
| 세대 | 1=베이비 붐 세대(1950~1964년생), 2=X세대(1965~1979년생), 3=M세대(1980년생~1995년생), 4=Z세대(1996년생~2010년생) | |
| 신뢰수준 |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믿을 수 없다, 2=별로 믿을 수 없다, 3=약간 믿을 수 있다, 4=매우 믿을 수 있다 |
|
| 주관적 만족감 |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한다, 2=약간 불만족한다, 3=보통이다, 4=약간 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 |
|
| 거주지 | 1=기타 지역, 2=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
| 배우자 여부 | 1=배우자 없음, 2=배우자 있음 |
Ⅳ. 연구 결과
<표 4>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 변수, 그리고 인구사회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이다. 준거집단은 기부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향후 기부의사가 없는 무관심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 A~C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의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항은 모든 모형에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주는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하석, 한성민, 2022). 이와 반대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은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기부행동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 (준거집단: 무관심 집단, N=8,377) | Model A | Model B | Model C | Model D | |
|---|---|---|---|---|---|
| 유형 | 변수 | exp(b) | exp(b) | exp(b) | exp(b) |
| 단순 의향 집단 (N=2,708) | 계층의식 | 1.601*** (0.0426) | 1.267*** (0.0465) | 1.594*** (0.0908) | 1.455*** (0.094) |
| 가구소득 | 1.153*** (0.0109) | 1.282*** (0.0370) | 1.234*** (0.039) | ||
| 가구소득*계층의식 | 0.926*** (0.0199) | 0.928*** (0.02) | |||
| 교육 정도 | 1.178*** (0.0182) | 1.186*** (0.021) | |||
|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2.928*** (0.091) | ||||
| 성별 (1=남성) | 1.163** (0.058) | ||||
| 세대 (1=베이비붐 세대) | |||||
| X세대 | 1.253*** (0.059) | ||||
| M세대 | 1.02 (0.068) | ||||
| Z세대 | 0.804* (0.109) | ||||
| 신뢰 정도 | 1.150*** (0.037) | ||||
| 주관적만족감 | 1.134*** (0.027) | ||||
| 거주지 (1=기타지역) | 1.253*** (0.05) | ||||
| 배우자 여부 | 1.219*** (0.059) | ||||
| 일시적 참여집단 (N=711) | 계층의식 | 2.082*** (0.0768) | 1.539*** (0.0834) | 2.048*** (0.1665) | 1.943*** (0.17) |
| 가구소득 | 1.199*** (0.0183) | 1.362*** (0.0645) | 1.364*** (0.067) | ||
| 가구소득*계층의식 | 0.915** (0.0339) | 0.909** (0.034) | |||
| 교육 정도 | 1.191*** (0.0323) | 1.263*** (0.035) | |||
|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4.827*** (0.125) | ||||
| 성별 (1=남성) | 1.498*** (0.101) | ||||
| 세대 (1=베이비붐 세대) | |||||
| X세대 | 0.768** (0.101) | ||||
| M세대 | 0.753* (0.114) | ||||
| Z세대 | 0.426*** (0.215) | ||||
| 신뢰 정도 | 0.890 (0.063) | ||||
| 주관적만족감 | 1.150** (0.048) | ||||
| 거주지 (1=기타지역) | 1.200* (0.088) | ||||
| 배우자 여부 | 1.238* (0.106) | ||||
| 적극적 참여집단 (N=3,472) | 계층의식 | 2.867*** (0.0415) | 1.864*** (0.0453) | 1.819*** (0.0918) | 1.625*** (0.099) |
| 가구소득 | 1.288*** (0.0100) | 1.296*** (0.0356) | 1.311*** (0.039) | ||
| 가구소득*계층의식 | 0.963* (0.0185) | 0.948** (0.020) | |||
| 교육 정도 | 1.448*** (0.0179) | 1.528*** (0.021) | |||
|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10.752*** (0.077) | ||||
| 성별 (1=남성) | 1.751*** (0.058) | ||||
| 세대 (1=베이비붐 세대) | |||||
| X세대 | 1.035 (0.058) | ||||
| M세대 | 0.626*** (0.068) | ||||
| Z세대 | 0.283*** (0.127) | ||||
| 신뢰 정도 | 1.145*** (0.037) | ||||
| 주관적만족감 | 1.286*** (0.028) | ||||
| 거주지 (1=기타지역) | 1.115* (0.052) | ||||
| 배우자 여부 | 1.1 (0.061) | ||||
| OBS | 15,268 | 15,268 | 15,268 | 15,268 | |
| Pseudo R2 | 0.0219 | 0.0430 | 0.0570 | 0.1081 | |
위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변수와 인구사회 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 D에서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인구사회 변인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기타 지역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부의사, 기부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MZ세대의 기부의사, 기부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①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집단(가구소득=9)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1> 단순 의향 집단과 <2> 일시적 참여집단에서는 기울기가 음(-)의 양상을 보였으나 <3> 적극적 참여집단에서는 기울기가 양(+)으로 바뀌었다. 또한 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은 소득과 계층의식이 모두 높을수록(가구소득=9, 주관적 계층의식=3) 가장 높았다. 이는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높은 이들이 기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②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집단(가구소득=1)의 경우 일관적으로 <1> 단순 의향 집단, <2> 일시적 참여집단, <3> 적극적 참여집단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기울기가 양(+) 의 양상을 보였다. 즉, <표 4>에서 보았듯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집단은 저소득자 집단인 것이다.
표 5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 효과
| <1> Pr(Y=2, 단순 의향 집단) | <2> Pr(Y=3, 일시적 참여집단) | <3> Pr(Y=4, 적극적 참여집단) |
|---|---|---|
|
|
|
|
정리하면, 첫째, 고소득자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할수록 기부에 의사만 보이거나 참여만 할 확률은 낮아지지만 기부에 의사와 참여를 동시에 보일 확률이 증가하여 기부 의사와 기부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가구소득=1)의 기부 의사와 기부 참여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결론 및 시사점에서도 변수 각각의 영향을 살펴본 이후 이 두 결과(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겠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득과 계층의식이 모두 높은 이들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부에 관심을 보인다면, 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사회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될 만큼의 좋은 지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각각의 변수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이후, 상호작용항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인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할 때 고소득 집단(가구소득=9)과 저소득 집단(가구소득=1)의 기부 행동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구 결과, 객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은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홍은진, 2005; 김자영, 김두섭, 2013; 박정훈, 이상무, 2024; 노법래, 김소영, 2019; 양성욱, 2018; 고경환 외, 2018; 강철희, 2012a). 또한, 학력과 나눔행동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Houston(2006), Musick & Wilson(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결과과 관련하여,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위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나 상위 욕구(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수록 인정, 성취와 같은 사회적 욕구의 성격을 띤다(Maslow, 1943). 이 때, 사회적 욕구의 효용은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고소득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였기에 사회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부를 통해 고소득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긍정적인 평판과 사회적 자본을 얻음으로써(Brown & Ferris, 2007)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여, 이는 적극적인 기부활동의 동기부여가 된다(Suss, 2023).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Andreoni(1990)의 온광효과와 일맥상통한다. 순수하지 않은 이타심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정신적 만족감, 혹은 사회적 욕구와 인정 등의 효용을 동기로 기부에 참여하며 사회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보상의 한계효용이 높은 고소득자는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Durkheim(1951), Mead(1934), Tajfel(1978)의 연구에서 언급한 준거집단의 규범이 작동한다면, 위의 결과를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기부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더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게 되어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정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Bekkers & Wiepking, 2011).
하지만 Piff et al.(2010)의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타인의 복지와 필요에 더 민감하여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국외 연구들도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오히려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즉, <표 4>에서 볼 수 있듯, 본 연구의 결과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타적 행동(기부, 신뢰, 도움 행동, 등)을 보인다고 주장한 Piff et al.(2010)의 연구와 전반적으로 반대된다. 또한, 변수 각각의 기부행동으로의 영향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소득과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Piff et al.(2010)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래의 상호작용항 그래프의 해석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표 5>에서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높은 이들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지위, 특히 소득 수준이 낮아도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 행동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집단 내(가구소득=1 집단, 가구소득=9 집단)에서도 기부패턴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앞서 언급한 Tajfel(1978)의 사회정체성 이론은 기부 행동 패턴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2가지 결과―1) 고소득자의(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소득=9)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할수록 기부에 의사만 보이거나 참여만 할 확률은 낮아지고 기부에 의사와 참여를 동시에 보일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기부 의사와 기부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2)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소득=1)의 기부 의사와 기부 참여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에 집중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① 첫째,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할 때 <1>단순 의향 집단, <2>일 시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3>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한다. 이는 객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소득 수준=9) 주관적 사회적 지위(주관적 계층의식)가 높아질수록 단발적인 기부 참여와 기부 의사보다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개인은 자신과 동일한 계층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개인의 행동을 의식하며 이를 준거집단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고소득자이면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인 사람들, 다시 말해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준거집단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지속적 기부활동을 높은 확률로 보이게 될 수 있다(Tajfel, 1978).
② 둘째,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일 때,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단순 의향 집단, 일시적 참여집단, 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즉, 가구소득=1(100만 원 미만)일 때 계층의식이 증가할수록, 단순 의향 집단의 경우 현재에는 생활고로 인해 기부할 여력이 없으나 언젠가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시적 기부집단의 경우에는 과거 기부에 참여는 했으나 현재 소득의 부족으로 추후 기부에 참여 여부의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으로, 적극적 참여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속한 계층의식이 높은 준거집단의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표 5>의 <3>을 보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참여집단에 속할 확률의 증가 폭이 약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부르디외의 자본 유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의 자본 유형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본의 양을 통해 장(field)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거나 현재의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Bourdieu, 1986). 경제적 자원(소득)은 부족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은 높은 이들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자본을 사회적 자본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으려는 욕구가 강력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고소득자에 비해 더욱 클 수 있으며, <표 5>에서 보듯 저소득자일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 때 기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확률의 증가 폭이 고소득자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저소득층에 비해 기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①과 ②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소득 수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기부활동 참여, 친사회적 행동을 보고한 일부 국외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Wiepking, 2007; 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Keltner et al., 2014; Piff & Robinson, 2017). 특히 Piff et al.(2010)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표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표가 모두 낮을수록 기부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표가 모두 높거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표(소득)가 낮음에도 주관적 사회적 지위(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이 두 지표가 모두 낮은 이들보다 기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고소득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부에 대해 사회적 압박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Weiss-Sidi & Reimer, 2023; Siemens et al., 2020). 한국은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며, 상위 소득층과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이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부 행동 규범이 상대적으로 명확할 수 있다, Hofstede(1984)의 문화 차원 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에 따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ofstede, 1984). 즉, 서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를 띠는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개인적 경험과 공감으로 인해 기부에 참여하기보다는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규범과 책임을 동기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Siemens et al.(2020)의 연구 또한 한국과 같은 엄격한 문화(tight culture)에서는 기부의 동인을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동기로 간주한 바 있다. 또한, 앞서 Bourdieu(1986)의 이론에서 확인하였듯, 상위 계층은 그들의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기부와 같은 이타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압박은 고소득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 저소득층이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 비해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띠는 서구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규범적 기부행위보다 저소득층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 및 사회적 자본, 공감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기부 동인이 강력할 수 있다(Piff et al., 2010). 특히, Weiss-Sidi & Reimer(2023)의 연구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의 기부는 사회적 규범과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기부가 자기만족과 행복,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부는 주로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행동일 수 있는 데 반해, 서구에서의 기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기부 동인이 강해, 본 연구를 비롯한 국내 연구와 Piff et al.(2010)와 같은 국외 연구(Wiepking, 2007; Piff et al., 2010; Kraus & Keltner, 2009; Keltner et al., 2014; Piff & Robinson, 2017)에서 기부행동과 사회적 지위의 연관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외,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개인의 추측일 뿐, 국가 및 문화척 차이에 따른 소득, 계층의식과 기부행동의 패턴은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모형과 같은 적절한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세대 변수 역시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Z세대의 기부의사와 기부 참여 확률이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자원봉사 참여는 강철희 외(2012a)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 의사와 기부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시적 참여집단의 자원봉사 참여 변수의 Odds ratio인 4.827(p<0.001), 단순 의사 집단(Odds ratio=2.928, p<0.001)에 비해 적극적 참여집단(Odds ratio=10.752, p<0.001)의 자원봉사 계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부와 자원봉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보완적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가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의 이항 변수이기에 기부 금액, 자원봉사 참여 시간과 같은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변수를 활용해 더욱 강건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중 확실한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여성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기부의사와 기부참여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 변수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위를 객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한 이후, 모형 D에 인구사회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 A~C의 결과와 모두 일치하여 연구 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23년 한 시점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종단모형, 가령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기부행동을 단순히 참여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강철희, 이지연(2019)에 따르면 시민들의 삶에서 기부와 같은 나눔 행동은 단순한 참여 여부보다는 몰입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눔 행동에 투입한 시간,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후행 연구에서는 기부의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부 횟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연구가 국내 연구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국가별 국민이라는 모집단의 차이로 부터 나타나는 결과인지, 특정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규범적 기부행동과 공감,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기부행동의 차이점에 따른 결과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국가 표본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다층모형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설문 데이터와 GDP, 실업률과 같은 거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면 더 강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강철희 외(2016)가 지적하였듯 소득 변수를 단순한 가구소득으로 통합하여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재산소득, 이전소득, 상속소득 등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분석은 가구소득이 낮은 저소득자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부에 참여한다는 사실,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높은 이들 또한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의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와 본 연구를 포함한 국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인의 기부 동인에 대해 기존의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초저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양극화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두운 키워드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나눔 행동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 (2024). 사회단체 활동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6(1), 83-9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76627 .
, . (2015).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5(1), 83-10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74569 .
.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50566 .
, et al.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PubMed]
, , & (2015).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41(3), 574-601. [PubMed]
, &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569-582. [PubMed]
, , , & (2014). The sociocultural appraisals, values, and emotions (SAVE) framework of prosociality: Core processes from gene to mem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425-460. [PubMed]
, &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1), 99-106. [PubMed]
, & (2017). Social class and prosocial behavior: Current evidence, caveats, and ques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6-10. [PubMed]
, , , , &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07-21
- 수정일Revised Date
- 2024-09-30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4-11-11

- 510Download
- 1363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