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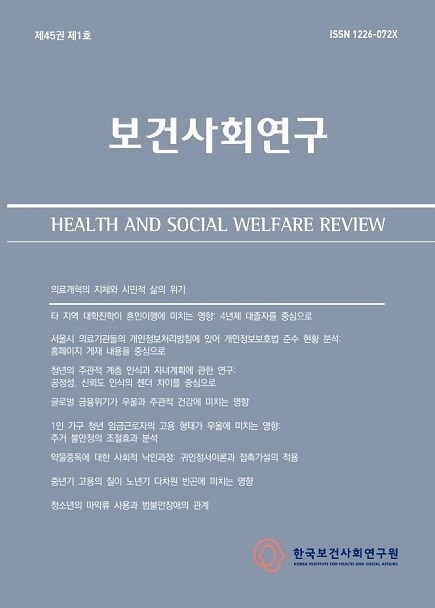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Homicide-Suicide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Mi Ok1*; Kim, Hyun Ah1; Kim, Hyun Jung1
보건사회연구, Vol.45, No.1, pp.407-428, March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1.407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살해 및 자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증가함에도 말이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실태 및 그 이면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드러내어, 보다 두터운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 더욱 취약하며, 부모의 돌봄부담과 우울, 자녀의 도전행동 등과도 관련이 있다. 자살 시도 이후 그 결과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서, 자살생존자 등을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부모의 돌봄부담 감소 및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 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ircumstances and realities surrounding cases of child homicide followed by parental suicide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52 news reports related to the homicid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shed since 2000 in BIG Kind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2000 to 2023, an average of 1 to 3 cases of child homicide invol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ccurred annually. However, the number of cases tripl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cond,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involved in these incidents included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Third, the primary reasons for child homicide were identified as despair over the current situation, family hardships, and the burdens of caregiving. Lastly, the outcomes of attempted child homicide were as follows: 48.1% resulted in the child's death, while 51.9% involved both child homicide and parental suicide. Notably, a significant number of parents survived their suicide attempts, highlighting the need for support for these survivor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will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social support system.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관련된 상황과 그 실태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 Kinds)에 2000년 이후 보도된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등과 관련된 뉴스 5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1∼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시점에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 및 자녀 특성으로는 부모의 돌봄부담과 우울, 자녀의 도전행동 등이 빈번히 나타났다. 셋째, 자녀 살해 원인은 현재 상황 비관, 가족 애환, 양육 부담 등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살해 시도 결과는 자녀 살해 48.1%, 자녀 살해 후 자살 51.9%였다. 이 중 자살생존자도 상당수여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어려운 삶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두터운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Ⅰ. 서론
자녀 살해 후 자살, 이 용어를 사용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1) 대중매체에 종종 보도되는 이 어두운 현실은 우리 사회가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연구는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역학적 특성, 사회심리학적 탐색 등에 대해 주로 주목하였다(정승민, 2004, 이미숙, 2007; 이현정, 2012; 김명숙, 장창곡, 2022; 송오식, 2022). 이후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용어의 부정확성, 인권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족 살인 및 자살(김유리, 2017), 자녀 살해 후 자살(이세원, 2023; 김지혜, 2024) 등으로 용어가 변화되어 연구되고 있다. 대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치매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에 관해 연구되었다. 장애와 관련돼서는 관련 연구가 부재하였고, 김미옥 외(2023)에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자살생각 위험군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관찰되는 현실은 대중매체 등의 보도 그 너머,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삶의 고단함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일 것이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고, 특히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린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는 왜 여전히 부족한가? 지원 정책이 있어도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규제 안에 갇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신문 기사 등에 나타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실태를 통해, 그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관련 사회적 돌봄체계를 제안해 보고자 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복잡하고 누적적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평생 돌봄부담 뿐 아니라 부모사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 2020년 발달장애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 지원을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 었으며(하민지, 2020), 부모사후 자녀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이용근, 2002; 최해경, 2010). 발달장 애인의 부모가 가진 양육 부담은 그들의 인터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도전행동이 심각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육체가 살아 있으니 살아는 있겠지만, 피폐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좀비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김미옥 외, 2020).
이러한 어려움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건강 위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은영, 김은석, 2022).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같은 시기 비장애 자녀의 부모나, 다른 유형의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Shevchuk, 2021; Jahan et al., 2020). 이러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은 자녀 살해 및 자살 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 가족 중 58.9% 는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2), 발달장애 부모 중 43.5%는 자살생각 위험군으로 제시되었다(김미옥 외, 2023). 결과적으로 돌봄 제공자가 건강하지 않을 때 살해의 위험은 커지며(Frederick et al., 2022),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Marleau, 1999; Nordlund & Temrin, 2007; Guan et al., 2022). 이들 연구에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의 정신건강은 중요하며(Brown, 2012),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hubha et al., 2022).
지금까지 살펴본바,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부담 및 부모사후에 관한 걱정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여,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직계비속 살해 사건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77명 정도가 동거친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장애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 가족이 처한 현실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및 자살 관련 현실을 뉴스 내용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그 대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분석만으로 다양한 사례의 아프고 깊은 삶의 질곡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건 보도 속 숨겨진 사실과 실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모쪼록 이 연구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삶의 고단한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해본다.
Ⅱ. 문헌 고찰
1.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개념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친자녀 혹은 의붓자식을 살해한 뒤 일정 시간 이후 살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아라, 2022). 해외 연구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지칭할 때 murder-suicide와 homicide-suicide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Eliason, 2009; Knoll, 2016; Podlogar et al., 2018; Saleva et al., 2007),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homicide-suicide가 더 선호되고 있다(최진화, 박기환, 2022).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살해와 자살이라는 두 행위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나, 이를 규정하는 시간적 기준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다(김지혜, 2024).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살해 후 24시간 이내에 자살하거나, 며칠 또는 1주일 이내에 자살한 경우를 그 시간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연구 역시 존재한다(최진화, 박기환, 2022).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흔히 ‘동반자살’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사용은 부모의 ‘살해’ 행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 살해에 당사자의 동의가 부재하였다는 등의 국내 논의가 이루어져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김유리, 2017; 송오식, 2022; 이미숙, 2007; 이세원, 2023; 이현정, 2012). 이미숙(2007)과 이현정(2012)은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자녀 살해 사건에서 부모의 폭력성과 비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녀 살해-부모자살’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세원(2023)과 김유리(2017)는 ‘동반’ 개념이 ‘살해’ 행위를 축소할 수 있으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극단적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송오식 (2022)은 자녀 살해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최아라(2022) 역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 권리를 강조하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그간 ‘동반자살’로 알려진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연구자 간 그 시간적 정의에 차이가 있으며, 용어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된 논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이외에도 자녀 살해만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어, 이들 용어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 자녀 살해 후 자살 연구 동향
자녀 살해 후 자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다룬 국외 연구에서는 다수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Byard, 2005; Bäckström et al., 2019; Hanzlick & Koponen, 1994; Karlsson et al., 2021). 이와 유사하게 1992년에서 2001년 사이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8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여러 유형의 정신질환을 지닌 것으로 연구되었다(DIl et al., 2008).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공통 요인을 발견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저지른 아버지의 수가 어머니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부모가 우울증을 지니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Friedman et al,. 2005). 또한 최근 수행된 가족 살해 후 자살 연구에 의하면, 18개국 67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족 살해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가족 살해 사례의 약 절반이 가해자 자살로 이어졌고, 정신건강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Karlsson et al., 2021). 또한 김지혜(2024)의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보도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현황과 원인,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주로 40대 여성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본 이세원(2023)의 연구에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주요 추정 원인은 정신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정 인구 집단을 지정하지 않고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분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발생한 동반자살 사례를 살펴본 김명숙과 장창곡(2022)의 연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모-자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동기는 생활고가 29.4%로 주를 이루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도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살펴본 최아라(2022)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성별은 주로 여성이었으며, 피해자의 8.8%는 장애가 있었고,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였다. 이와 유사하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살펴본 최진화와 박기환 (2022)의 연구에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주원인은 정신건강 문제와 경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내외에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장애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만을 살펴본 연구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3.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연구 동향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높은 돌봄부담과 스트레스 및 우울을 경험하며, 낮은 소득수준과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21). 2020년 발달장애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 지원을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발달장애 가구의 월 평균수입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24.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하민지, 2020).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를 일상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돌봄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 성인기 혹은 장년기 이후나 부모의 죽음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부담감을 안고 있다(윤선미 외, 2022). 이는 곧 그들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이은영, 김은석, 2022).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적인 긴장을 경험하며, 그 결과 부모들은 비장애 자녀 부모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해경, 2010; Scherer & Kuper 2019).
특히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며 사회성 기술이 낮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서 제외되기 쉽다(김미옥 외, 2020; 김삼섭, 2016).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은 종종 지역사회에서 거부당하거나 공공시설에 서 부정적 시선을 받는다(전경화 외, 2019). 따라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및 환경 속에서 24시간 오롯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에서 나아가 깊은 삶의 굴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외, 2020; 전경화 외, 2019).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시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2), 발달장애인 가족 중 58.9%는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 부모는 43.5%로 높은 수준이었다(김미옥 외, 2023). 특히 부모의 건강이 취약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경제 수준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자살생각을 해본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옥 외, 2023).
자살생각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 자녀의 생활을 걱정하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데, 제주, 광주, 서울, 부산 등에서 연이어 관련 사건이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된 발달장애 자녀를 24시간 돌보면서 수시로 가족에게 “사는 것에 희망이 없다.”라고 언급하던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미수에 그치거나, 발달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를 혼내는 자신을 혐오하고, 자책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 하기도 하였다(이효정, 2021).
한편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및 자살 관련 뉴스 분석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비교적 활발한 실정이다. Shubha 외(2022)는 방글라데시에서 보도된 자폐 아동 살인 후 자살 뉴스 기사 24개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폐 아동 부모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 연구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호주 뉴스에서 드러난 네 건의 장애인 가족 살해 및 자살 사건 기사 보도 281건을 내용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Buiten & Cresciani, 2023), 영국 장애 성인의 부모 살해 사건을 분석한 Brown(2012)의 연구가 존재한다. 또한 1982년과 2010년 사이 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한 사례가 보도된 22개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 결과 살해된 자녀의 54%가 자폐 아동이었으며, 가해자의 30%가 정신질환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Coorg et al., 2012). 그러나 국내 발달 장애인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살해 및 자살 뉴스 분석 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을 다룬 뉴스 보도이다. 해당 뉴스는 이 연구에서 보도 검색 기간으로 설정한 시기(200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용어 등을 반영하여 다각도로 검색하였다. 즉, 이 24년의 기간 동안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정신지체ㆍ지적장애ㆍ발달장애ㆍ자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현실을 반영하여 뉴스를 검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첫째, 뉴스 제목이나 본문에 발달장애 관련 용어 중 중 1개라도 살해라는 단어와 같이 나와 있는 뉴스는 모두 살펴보았다. 둘째, 자녀 살해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살해 시도를 했으나 생존한 사례 및 기타 예외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도 그 결과가 사망인지 생존인지에 따라 모든 유형을 고려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살펴보았다.
검색 방법은 104개 언론사 뉴스를 빅데이터화 하여 운영 중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전국ㆍ경제ㆍ지역 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방송사, 전문지, 스포츠 신문, 인터넷 신문을 매체범주로 하며 지역별(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104개 언론의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 본 연구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뉴스 검색 기간 설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24년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2020년과 그 이후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게 미친 영향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빅카인즈에 보도된 기사를 모두 살펴보았으며,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검색 기간으로 설정(200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된 24년 동안의 발달장애와 살해, 자살 등의 키워드 뉴스를 검색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빅카인즈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많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를 찾는 데 있어, 매체를 특정하는 것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검색어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 중 1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면서 살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뉴스만을 선정하였다. 장애범주를 다양하게 하여 검색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의한 정신박약이 정신지체인[시행 1990.12.1.]에서 지적장애인[시행 2007.10. 15.]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시행 2000.1.1.]은 자폐성장애인[시행 2007.10.15.]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정의된 것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넷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검색어를 설정할 때 가해자를 부모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특징짓지 않은 것은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즉, 최대한 유사사례를 포함하기 위하여, 넓은 범주로 검색하여 1차에서 2,545개의 뉴스를 선별하였다. 다섯째, 앞서 선별된 2,545개의 뉴스 중 사진, 칼럼, 기고문, 여러 사건을 요약하여 보도한 기사와 2000년 1월 1일 이후 보도되었으나 1999년도 사건이 조명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여섯째, 하나의 사건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중복 자료는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뉴스를 모두 읽고 기준에 맞게 선별하여 총 50개의 뉴스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50개의 뉴스 사례를 모두 정독한 결과, 1건의 사례에서 3형제가 모두 살해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각각의 사건으로 집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50개의 뉴스에 나타난 52건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을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앞서 제시한 6단계에 걸친 자료 수집을 통해 선별된 뉴스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내용분석은 정보를 연구자가 선정한 명료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은 수의 내용 범주로 압축하는 체계적 기술이며 (Krippendorff, 1980; Stemler, 2001; 최재성 외, 2016에서 재인용), 기존의 정보를 유목화하고 요약과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직관적 판단으로 메시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원경, 2014). 아울러, 수집한 정보를 범주화 및 코딩하여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김지혜, 2024)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와 관련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을 다룬 뉴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도별 발생 현황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파악한 동거친족 살해 사건과 비교해 두 자료 간 사건 발생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특성 및 함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연도별 발생 현황
발달장애 자녀 살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형사사건으로,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의한 살해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법」 제250조에서는 살인죄에 살인과 존속살해만을 정의하고 있어 직계비속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내 통계 자료 중 직계비속 살해와 관련한 별도의 자료도 없어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활용해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 현황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동거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나 배우자를 말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혈족이기에 동거친족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 중 자료 검색을 통해 드러난 동거친족 살해 사건 뉴스 등 52건의 연도별 현황을 비교하였다.
우선, 뉴스를 통해 파악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은 지난 24년간 총 52건이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해 1~3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9건(17.3%)으로 거의 3배 이상의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시기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애인 이용시설은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복지기관에서의 낮활동 시간은 온전히 가족돌봄으로 채워야 했다. 2020년 사건 발생 건수 급증은 이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어려우나,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이용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돌봄부담 가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후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들어서 또다시 9건(17.3%)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친족 간 살해 사건이 2000년대 초반 5%대를 보이다가 3~4%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살펴보고자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2)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 사건은 2002년에 213건(5.7%)으로 가장 많고, 2015년 198건(5.3%)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발달장애 자녀 및 동거친족간 살해 사건 현황
| (단위 : 명(%)) | |||||||
|---|---|---|---|---|---|---|---|
| 연도 | 발생 빈도(비율) | 연도 | 발생 빈도(비율) | ||||
|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 | 동거친족간 살해 사건 |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 |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 | ||||
| 2000 | 1(1.9) | - | 2012 | - | 208(5.6) | ||
| 2001 | 1(1.9) | - | 2013 | 2(3.8) | 166(4.5) | ||
| 2002 | - | 213(5.7) | 2014 | 1(1.9) | 187(5.0) | ||
| 2003 | 1(1.9) | 191(5.1) | 2015 | 2(3.8) | 198(5.3) | ||
| 2004 | 2(3.8) | 201(5.4) | 2016 | 3(5.8) | 172(4.6) | ||
| 2005 | 1(1.9) | 195(5.2) | 2017 | 3(5.8) | 180(4.8) | ||
| 2006 | 2(3.8) | 142(3.8) | 2018 | 2(3.8) | 183(4.9) | ||
| 2007 | 2(3.8) | 163(4.4) | 2019 | 1(1.9) | 170(4.6) | ||
| 2008 | 1(1.9) | 149(4.0) | 2020 | 9(17.3) | 154(4.1) | ||
| 2009 | - | 179(4.8) | 2021 | 2(3.8) | 150(4.0) | ||
| 2010 | 2(3.8) | 182(4.9) | 2022 | 9(17.3) | 137(3.7) | ||
| 2011 | - | 195(5.2) | 2023 | 5(9.6) | - | ||
| 전체 | 52(100.0) | 3,715(100,0) | |||||
그림 1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및 동거친족간 살해 사건 비교
주: 막대그래프는 연도별 발달장애인 자녀의 살해 사건 현황이며, 꺾은선 그래프는 동거친족 간 살해 사건을 의미함.
출처:
-
1) “범죄분석통계”, 검찰청, 2005, 국가통계포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1994~2005), 2024. 10. 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86&conn_path=I3
-
2) “범죄분석통계”, 검찰청, 2023, 국가통계포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2024. 10. 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38&conn_path=I3
특히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많이 증가한 코로나19 시기에도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의 시기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발달장애 등 취약가구에 대한 별도의 안전 지원체계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ㆍ자녀 특성
가. 부모 특성
뉴스 분석을 통해 파악한 52건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에 나타난 부모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살해 사건 발생 시 자녀와의 관계는 부 25건(48.1%), 모 24건(46.2%)이었고, 부모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2건(3.8%) 이었다. 뉴스 자료만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 중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례는 1건(1.9%)이었다.
표 2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 부모의 특성
| (N=52, 단위: 명(%)) | |||||||
|---|---|---|---|---|---|---|---|
| 구분 | 빈도(비율) | 구분 | 빈도(비율) | ||||
| 자녀와의 관계 | 부1) | 25(48.1) | 질환 종류 | 디스크 | 없음 | 50(96.2) | |
| 모2) | 24(46.2) | 있음 | 2(3.8) | ||||
| 부모 | 2(3.8) | 공황장애 | 없음 | 51(98.1) | |||
| 확인 불가 | 1(1.9) | 있음 | 1(1.9) | ||||
| 연령 | 30∼39세 | 12(23.1) | 망상 | 없음 | 51(98.1) | ||
| 40∼49세 | 13(25.0) | 있음 | 1(1.9) | ||||
| 50∼59세 | 10(19.2) | 불면증 | 없음 | 51(98.1) | |||
| 60∼69세 | 11(21.2) | 있음 | 1(1.9) | ||||
| 70∼79세 | 5(9.6) | 불안증세 | 없음 | 50(96.2) | |||
| 확인 불가 | 1(1.9) | 있음 | 2(3.8) | ||||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1(1.9) | 산후우울증 | 없음 | 51(98.1) | ||
| 해당 없음 | 51(98.1) | 있음 | 1(1.9) | ||||
| 질환 여부 | 없음 | 37(71.2) | 우울증 | 없음 | 44(84.6) | ||
| 있음 | 15(28.8) | 있음 | 8(15.4) | ||||
| 질환 종류 | 고혈압 | 없음 | 51(98.1) | 정신질환 | 없음 | 51(98.1) | |
| 있음 | 1(1.9) | 있음 | 1(1.9) | ||||
| 관절염 | 없음 | 51(98.1) | 조울증 | 없음 | 51(98.1) | ||
| 있음 | 1(1.9) | 있음 | 1(1.9) | ||||
| 다리 골절 | 없음 | 51(98.1) | 경제 수준 | 해당 없음 | 40(78.9) | ||
| 있음 | 1(1.9) | 어려움 | 12(23.1) | ||||
| 암 | 없음 | 49(94.2) | |||||
| 있음 | 3(5.8) | ||||||
부모의 연령은 40~49세 13건(25.0%), 30~39세 12건(23.1%), 60~69세 11건(21.2%), 50~59세 10건 (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대에서도 5건(9.6%)이 보고되었다.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30대나 60대, 50대 역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서, 부모 연령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유형은 51건(98.1%)이 부모에겐 장애가 없었으며, 단 1명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지적장애가 부인지 모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모의 질환은 15건(28.8%)을 차지했으며, 질환 종류로는 우울증이 8건(15.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 산후우울증, 정신질환, 조울증 등이 각 1~2건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큼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보도된 자료 중 경제 수준이 어렵다고 파악된 사례는 12건(23.1%)으로 나타났다.
나. 자녀 특성
뉴스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0건(76.9%)으로 여성 12건(23.1%)보다 약 3.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가 남성에게 더 많이 출현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1~9세가 13건(2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29세 12건(23.1%). 10~19세 9건(17.3%)의 순이었다. 그 비율은 낮지만, 생후 4개월(1명)과 6개월(2명) 영아 3명(5.8%)도 부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발달장애 살해 사건 자녀의 특성
| (N=52, 단위 : 명(%)) | |||||||
|---|---|---|---|---|---|---|---|
| 구분 | 빈도(비율) | 구분 | 빈도(비율) | ||||
| 성별 | 남성 | 40(76.9) | 중복장애 유형 | 언어장애 | 없음 | 51(98.1) | |
| 여성 | 12(23.1) | 있음 | 1(1.9) | ||||
| 연령 | 1세 미만 | 3(5.8) | 질환 여부 | 없음 | 49(94.2) | ||
| 1~9세 | 13(25.0) | 있음 | 3(5.8) | ||||
| 10~19세 | 9(17.3) | 질환 종류 | 대장암 | 없음 | 51(98.1) | ||
| 20~29세 | 12(23.1) | 있음 | 1(1.9) | ||||
| 30~39세 | 7(13.5) | 심장기형 | 없음 | 51(98.1) | |||
| 40세 이상 | 6(11.5) | 있음 | 1(1.9) | ||||
| 확인 불가 | 2(3.8) | 시력 손실 | 없음 | 51(98.1) | |||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33(63.5) | 있음 | 1(1.9) | |||
| 자폐성장애 | 5(9.6) | 우울증 증세 | 없음 | 51(98.1) | |||
| 발달장애 | 10(19.2) | 있음 | 1(1.9) | ||||
| 미등록 | 2(3.8) | 정신병 증세 | 없음 | 51(98.1) | |||
| 확인 불가 | 2(3.8) | 있음 | 1(1.9) | ||||
| 장애정도 | 심한 장애 | 48(92.3) | 도전행동 | 없음 | 44(84.6) | ||
| 미등록 | 2(3.8) | 있음 | 8(15.4) | ||||
| 확인 불가 | 2(3.8) | 도전행동 유형 | 자해행동 | 없음 | 50(96.2) | ||
| 중복장애 | 없음 | 46(88.5) | 있음 | 2(3.8) | |||
| 있음 | 6(11.5) | 타해행동 | 없음 | 48(92.3) | |||
| 중복장애 유형 | 뇌전증 | 없음 | 50(96.2) | 있음 | 4(7.7) | ||
| 있음 | 2(3.8) | 성행동 | 없음 | 51(98.1) | |||
| 뇌병변 | 없음 | 51(98.1) | 있음 | 1(1.9) | |||
| 있음 | 1(1.9) | 기물파손 | 없음 | 51(98.1) | |||
| 지체장애 | 없음 | 51(98.1) | 있음 | 1(1.9) | |||
| 있음 | 1(1.9) | 기타행동 | 없음 | 47(90.4) | |||
| 시각장애 | 없음 | 51(98.1) | 있음 | 5(9.6) | |||
| 있음 | 1(1.9) | ||||||
장애유형에서는 지적장애가 33건(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애 미등록 비율 2건 (3.8%)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발달재활서비스만 이용한 사례(6세)와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살해한 경우(6개월)이다. 즉, 장애 진단을 받기도 전에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살해된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기 지원이 있었다면, 살해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석 자료 중 2건(3.8%)의 자료에서는 뉴스 내용만으로 장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각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7세 아이에게 자폐증세가 있다”와 “생후 4개월 된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장애 진단을 받고 등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인지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확인 불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한다. 이에 의하면, 장애 정도는 48건(92.3%)이 심한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부모의 언급만으로 장애 정도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는 각 미등록 및 확인 불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중복장애는 전체 분석 대상 중 6건(11.5%)만 해당하였으며, 뇌전증 50건(3.8%), 뇌병변 51건(1.9%), 지체장애 51건 (1.9%), 시각장애 51건(1.9%), 언어장애 1건(1.9%)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장애 이외에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3건(5.8%)을 차지해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체감하는 이중고는 매우 클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질환으로는 대장암, 심장기형, 시력 손실, 우울증 증세, 정신병 증세 등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도전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어려움이 되는데(Emerson et al., 1988) 전체 사례 중 8건 (15.4%)에서 도전행동이 확인되었다. 그 유형으로 기타행동 5건(9.6%), 타해행동 4건(7.7%), 자해행동 2건 (3.8%), 성행동 1건(1.9%), 기물파손 1건(1.9%)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타해행동은 행패, 폭행, 난폭한 성향, 난폭한 행동, 공격 성향이 심함, 사람을 가리지 않고 꼬집고 할퀴고 머리채를 잡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성행동은 가족과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아울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기타행동에는 잦은 소란, 소리 지름, 고함을 지름, 벽을 두드림, 본인 및 주위 사람 옷을 찢음 등이 포함되었다. 도전행동을 보이는 자녀는 8건(15.4%)에 불과했으나, 그 유형으로는 자해 및 타해, 성행동 등 발달장애 자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등에게도 안전 등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부담이 매우 클 수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표 3>의 결과만으로는 발달장애뿐 아니라 중복장애, 질환, 도전행동 등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중첩되었을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뉴스 검색 결과만으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향후 이들 특성이 부모의 자녀돌봄과 어떻게 연관되고, 이들이 자녀 살해 및 자살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다각도의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것이다.
3.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원인
가. 자녀 살해 원인 실태3)
발달장애 자녀 살해의 원인 및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살해 원인으로는 총 1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돌봄부담이 16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제문제 12건(23.1%)과 정신건강 9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부담에서는 보호자의 기력이 쇠하여 더는 간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장애 가족이 돌봄을 하면서 느끼는 힘듦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경제문제에서는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부모의 우울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발달장애 자녀 살해 원인 실태
| (N=52, 단위 : 명(%)) | ||||||||
|---|---|---|---|---|---|---|---|---|
| 구분 | 빈도(비율) | 구분 | 빈도(비율) | 구분 | 빈도(비율) | |||
| 가정불화 | 없음 | 49(94.2) | 생활습관 | 없음 | 46(88.5) | 정신건강 | 없음 | 43(82.7) |
| 있음 | 3(5.8) | 있음 | 6(11.5) | 있음 | 9(17.3) | |||
| 경제문제 | 없음 | 40(76.9) | 신변비관 | 없음 | 46(88.5) | 죽음암시 | 없음 | 51(98.1) |
| 있음 | 12(23.1) | 있음 | 6(11.5) | 있음 | 1(1.9) | |||
| 도전행동 | 없음 | 49(94.2) | 신체건강 | 없음 | 46(88.5) | 범죄행위 | 없음 | 48(92.3) |
| 있음 | 3(5.8) | 있음 | 6(11.5) | 있음 | 4(7.7) | |||
| 돌봄부담 | 없음 | 36(69.2) | 아동학대 | 없음 | 48(92.3) | 이용시설 | 없음 | 48(92.3) |
| 있음 | 16(30.8) | 있음 | 4(7.7) | 있음 | 4(7.7) | |||
| 부모사후 | 없음 | 48(92.3) | 장애비관 | 없음 | 46(88.5) | 확인불가 | 없음 | 50(96.2) |
| 있음 | 4(7.7) | 있음 | 6(11.5) | 있음 | 2(3.8) | |||
이 외에 자녀의 생활습관, 본인 및 자녀의 신변비관, 보호자의 신체건강, 자녀의 장애를 비관하는게 각 6건 (11.5%)으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생활습관에서는 자녀의 용변 처리와 식생활 등의 사유가 있음이 나타났다. 신변비관 범주를 살펴보면, 자녀 및 장애가족이 놓인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의 신체건강에서는 암 등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비관에서는 자녀의 장애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소견과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염려하여 살해한 예도 있었다.
높은 비율을 아니지만, 부모사후 4건(7.7%), 도전행동 3건(5.8%),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사유 4건(7.7%)도 있었다. 특히 부모사후 돌봄부담과 염려는 그동안 발달장애 가족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어왔던 이슈로, 자녀 살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전행동 역시 5.8%에 불과하지만, 자녀 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해당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매우 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 자녀 살해 원인의 연도별 추이
연도별로 지난 24년간 발생한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내용을 단일 및 복합 원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단일 원인의 범주는 가정불화, 경제문제, 도전행동, 돌봄부담, 생활습관, 아동학대, 장애비관, 정신건강, 범죄행위, 사유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확인불가)이며,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그 원인을 총망라해 범주별로 집계하였다. 뉴스 보도를 내용분석하여 자녀 살해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녀 살해 및 부모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현실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사한 내용이 빈번히 발견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가 더욱 세심하게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표 5
연도별 자녀 살해 원인
| (N=52, 단위 : 건(%)) | ||||||||||||
|---|---|---|---|---|---|---|---|---|---|---|---|---|
| 구분 | 2000 | 2001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10 | 2013 | 빈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단일 원인 | 가정불화 | - | - | - | 1 | - | - | - | - | - | - | 1(1.9) |
| 경제문제 | - | - | - | - | (1) | - | 1 | 1 | (1) | - | 4(7.7) | |
| 도전행동 | 1 | - | - | - | - | - | 1 | - | - | - | 2(3.8) | |
| 돌봄부담 | - | - | (1) | - | - | - | (1) | (1) | (1) | - | 4(7.7) | |
| 생활습관 | - | 1 | - | - | 1 | - | (1) | - | 1(1) | - | 5(9.6) | |
| 아동학대 | - | - | - | 1(1) | - | - | - | - | (1) | - | 3(5.8) | |
| 장애비관 | - | - | 1 | - | - | - | (2) | - | (1) | - | 4(7.7) | |
| 정신건강 | - | - | - | - | - | - | - | - | 1(1) | - | 2(3.8) | |
| 범죄행위 | - | - | - | - | - | - | (1) | - | - | - | 1(1.9) | |
| 확인불가 | - | - | - | - | - | - | - | - | (1) | (1) | 2(3.8) | |
| 가정불화+아동학대 | - | - | - | (1) | - | - | - | - | - | - | 1(1.9) | |
| 가정불화+돌봄부담+정신건강 | - | - | - | - | - | - | (1) | - | - | - | 1(1.9) | |
| 경제문제+돌봄부담 | - | - | (1) | - | - | (1) | - | - | - | - | 2(3.8) | |
| 복합 원인 | 경제문제+범죄행위 | - | - | - | - | - | - | - | - | - | (3) | 3(5.8) |
| 경제문제+부모사후+신체건강+정신건강 | - | - | - | - | - | - | - | - | (1) | - | 1(1.9) | |
| 경제문제+장애비관 | - | - | - | - | - | 1 | - | - | - | - | 1(1.9) | |
| 경제문제+정신건강 | - | - | - | - | - | 1 | - | - | - | - | 1(1.9) | |
| 도전행동+돌봄부담+부모사후+ 신체건강+이용시설 | - | - | - | - | (1) | - | - | - | - | - | 1(1.9) | |
| 돌봄부담+신변비관 | 1 | - | - | - | - | - | - | - | - | - | 1(1.9) | |
| 돌봄부담+신변비관+신체건강 | - | - | (1) | - | - | - | - | - | - | - | 1(1.9) | |
| 돌봄부담+신변비관+이용시설 | - | - | - | - | - | - | - | - | - | 1 | 1(1.9) | |
| 돌봄부담+신변비관+정신건강 | - | - | - | - | - | - | - | - | - | 1 | 1(1.9) | |
| 돌봄부담+신체건강 | - | - | - | - | - | - | - | - | - | (1) | 1(1.9) | |
| 돌봄부담+이용시설 | - | - | - | - | - | - | (2) | - | - | - | 2(3.8) | |
| 돌봄부담+장애비관 | - | - | - | (1) | - | - | - | - | - | - | 1(1.9) | |
| 부모사후+신변비관+신체건강 | (1) | - | - | - | - | - | - | - | - | 1(1.9) | ||
| 부모사후+정신건강 | - | - | - | - | - | - | - | - | (1) | - | 1(1.9) | |
| 생활습관+신체건강 | - | - | - | - | - | - | (1) | - | - | 1(1.9) | ||
| 신변비관+정신건강 | (1) | - | - | - | - | - | - | - | - | 1(1.9) | ||
| 정신건강+죽음암시 | - | - | - | - | - | - | (1) | - | - | - | 1(1.9) | |
| 전체 | 52(100.0) | |||||||||||
분석 결과 단일 원인은 10개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자녀의 생활습관(9.6%), 경제문제(7.7%), 돌봄부담(7.7%), 장애비관(7.7%)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복합 원인 20개 중 경제문제와 범죄행위(5.8%), 경제문제와 돌봄부담(3.8%), 돌봄부담과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3.8%) 사례가 발달장애 자녀 살해 원인으로 드러났다.
단일 원인 및 복합 원인 모두를 포함하였을 때 돌봄부담이 30.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문제(23.1%)와 정신건강(17.3%)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 자녀의 생활습관, 본인 및 자녀의 신변비관, 보호자의 신체건강 문제, 자녀의 장애를 비관하는 항목은 동일하게 11.5%의 비율로 나타났다.
비록 높은 비율을 아니지만 장애비관(11.5%), 부모사후(7.7%),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사유(7.7%), 도전행동(3.8%)은 비장애가족과 달리 발달장애 가족에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자녀 살해 원인은 <표 4>를 통해 제시한 살해 원인 15가지 범주를 연도별 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크게는 단일 원인과 복합 원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3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가족에게는 비장애 가족과는 달리 장애를 비관하거나 부모사후 남겨질 자녀를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이용하거나 자녀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유형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에게서 볼 수 있는 도전행동 또한 차이점으로 둘 수 있다.
4. 발달장애 자녀 살해 결과 유형
가. 살해의 결과로 본 유형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 사례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자녀 살해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자녀 살해 후 상황은 크게 자녀 살해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2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해 보면, 각 범주에 따라 대상자의 사망, 생존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표 6
발달장애 자녀 살해 결과로 본 유형
| (N=52, 단위 : 명(%)) | ||
|---|---|---|
| 구분 | 유형 | 빈도(비율) |
| 자녀 살해 | 자녀살해(사망) | 20(38.5) |
| 자녀살해(생존) | 5(9.6) | |
| 소계 | 25(48.1) | |
| 자녀 살해 후 자살 | 자녀살해(사망) 후 자살(생존) | 6(11.5) |
| 자녀살해(사망) 후 자살(사망) | 17(32.7) | |
| 자녀살해(생존) 후 자살(생존) | 4(7.7) | |
| 소계 | 27(51.9) | |
| 전체 | 52(100.0) | |
그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이 27건(51.9%)으로 자녀 살해 25건(48.1%)보다 다소 높게 집계되었다. 먼저, 자녀 살해 범주에서는 자녀가 사망에 이른 사례가 20건(38.5%)으로 생존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는 자녀와 부모 모두 사망한 사례가 17건(32.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녀만 사망하고 부모는 생존한 경우는 6건(11.5%)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자녀와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는 4건(7.7%)으로 집계되었다.
나. 연도별 결과로 본 유형
연도별 결과로 살펴본 본 유형을 구체화해보면, <표 7>과 같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6년간 27건(51.9%)의 사건이 있던 반면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은 25건 (48.1%)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높은 비율로 사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 자녀 살해 결과
| (N=52, 단위 : 명(%)) | ||||||||||||
|---|---|---|---|---|---|---|---|---|---|---|---|---|
| 구분 | 2000 | 2001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10 | 2013 | 빈도(%)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자녀살해 | 자녀살해(사망) | 1 | 1 | (1) | 1(3) | 1 | - | 1(6) | (1) | 1(2) | 1 | 20(38.5) |
| 자녀살해(생존) | - | - | - | 1 | - | 1 | 1 | - | (2) | - | 5(9.6) | |
|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 | 자녀살해(사망)후 자살(생존) | - | (1) | (1) | - | (1) | - | - | - | (3) | - | 6(11.5) |
| 자녀살해(사망)후 자살(사망) | 1 | (1) | 1(1) | - | - | 1 | (2) | 1(1) | 1(2) | (5) | 17(32.7) | |
| 자녀살해(생존)후 자살(생존) | - | - | - | - | (1) | (1) | (1) | - | - | 1 | 4(7.7) | |
| 전체 | 52(100.0) |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2020년에는 총 9건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자녀 살해(사망) 6건, 자녀 살해(사망) 후 자살(사망) 2건, 자녀 살해(생존) 후 자살(생존)이 1건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일한 빈도를 보인 2022년에는 자녀 살해(사망) 2건, 자녀 살해(생존) 2건, 자녀 살해(사망) 후 자살(생존) 3건, 자녀 살해(사망) 후 자살(사망) 2건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에 총 5건의 사건이 있었으며 모두 자녀 살해(사망) 후 자살(사망)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종종 보도된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 사건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 Kinds)에서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및 자살과 관련한 뉴스를 자료수집하고,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1∼3건 정도 보도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은 종전의 경향과 다르게 사건 발생 수가 7건(15.9%)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들어서 총 9건(20.5%)을 보여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동거친족 사건의 추이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등의 시기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어려움이 매우 컸음을 유추하도록 해준다.
둘째, 부모 및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모(母)인 사례가 50.0%로 부(⽗)보다 6.8%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4.5%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연령은 30∼39세(27.3%), 40∼49세(25.0%), 60∼69 세(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31.8%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우울증이 18.2%로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도된 자료 중 경제 수준이 어렵다고 파악된 사례는 18.2%로 집계되었다. 자녀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72.7%로 여성의 27.3%에 비해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1∼9세가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후 4개월과 6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도 6.8%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및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사례 중 7건(15.9)에서 도전행동이 확인되었으며 그 유형으로 타해행동(9.1%), 기타행동(9.1), 자해행동(4.5%), 성행동(2.3%), 기물파손(2.3%)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살해 원인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 가족의 애환, 양육 부담, 자녀의 생활 습관, 도전행동, 욕설, 용변 처리, 고통 감소, 장애 진단,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자녀 살해 결과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사건으로 43.2%의 비율을 보였으며,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20.5%로 나타났다. 자녀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도 13.6%였다. 그 결과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위기에 처해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최근 동거친족간 살해 빈도가 감소 추세인 반면,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빈도는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시점에 3배 이상 폭증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지원체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부담 어려움과 사각지대가 완화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가질 수 있었음을 예측하게 한다. 코로나19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장애인복지기관들은 이용할 수 없었고. 발달장애 자녀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진 상태였다. 이는 단순히 돌봄부담을 넘어 자녀 살해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지나갔지만, 유사한 고위험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조기 지원체계 및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 및 자녀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되었다. 부모의 경우, 우울 15.4%, 불안 3.3%, 그 외 정신질환 및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경우, 도전행동이 15.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당시 부모의 정신건강이 매우 고위험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의 도전행동 여부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이 부모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김미옥 외, 2023)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심리적 부검 등 비장애인 자살에 대한 다양한 원인 추적연구 등과 달리, 장애 분야 특히 발달장애 자녀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없다. 국가 통계 자료에서도 장애인 자살 및 발달장애 관련 자살 기초통계 마저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애 분야에서 부정적이고 터부시되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한적이지만, 뉴스 분석 등을 통해 자녀의 도전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 등이 자녀 살해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에 의거하여,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202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정책이 제안되었으나,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정책주간지 K-공감, 2024)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장애인복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나, 전 국민 정신건강지원체계 안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의 일상적 마음돌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살 예방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 안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 자녀 살해 원인으로는 총 1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중 돌봄부담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제(23.1%)와 정신건강(1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돌봄부담에서는 보호자의 기력이 쇠하여 더는 간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장애가족이 돌봄을 하면서 느끼는 힘듦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경제문제에서는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부모에게 생긴 우울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봄부담은 그동안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이슈이나, 돌봄부담과 우울이 동시에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간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분석만으로도 15가지 단일 및 복합 원인이 드러나서, 이들 원인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9%로 나타나서(김미옥 외, 2023), 자살생 각에서 극단적인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거친족살해와 발달장애 가족에서 나타나는 살해 사건의 변화추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슈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왜 이들이 결과적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살예방센터 등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에 따른 별도의 센터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예방과 관련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이들 가족이 직면한 자녀 살해 및 자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고 휘발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에도 보도되지 못하는 또 다른 소외와 사회적 배재로 남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살해 및 자살에 관한 심리적 부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장애인복지 제도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달체계에서도 고민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발달장애 자녀 살해 시도 후 생존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자살생존자는 발달 장애 자녀일 수도 그 부모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2건 중 자녀 살해는 48.1%,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은 51.9%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이세원(2023)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Child Death Review) 등을 제안하며, 부모의 정신질환 치료 시 아동 자녀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남겨진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지혜(2024)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아동학대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심리적 부검 등에 대한 적극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병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촘촘한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 자녀의 살해 사건 당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비율은 4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기 이전에 아동이고, 청소년인 미성년자이다. 아동복지 분야에서 고려되는 학대의 가능성, 심리적 부검,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및 원인 분석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및 장애인복지 차원 모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자살생존자를 위한 사례관리가 밀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 생존자의 삶은 부모로서는 그야말로 참혹함을, 발달장애 자녀 입장에서는 주 돌봄자의 상실로 인한 고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생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및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생존자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발달장애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장애인복지뿐 아니라 고위험 가구로서 위기가정 발굴을 통한 건강가정센터에서의 위기지원,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다각도의 발굴 및 지원체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 등에 대한 기초 통계,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비속에 의한 살인사건도 국가적으로 법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통계시스템 역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가족의 살해 원인 및 결과는 비장애 가족과 다른 양상일 수 있다. 따라서 별도 관리를 통해 그 추이를 관찰하고 그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자료 통계조차 없는 국내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 이상 자살이라는 자극적이고 부정적 용어에 위축되지 않고, 장애 및 발달장애 등에 대한 국가기초통계 자료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살인사건을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뉴스에 보도된 사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보도 내용 이상의 사건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뉴스에 보도된 내용만을 분석하였기에 원자료의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부모, 자녀의 특성 및 살해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더 심층적인 현실 이해를 위한 질적 사례 연구, 심리적 부검, 판례분석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및 자살이라는 그동안 감추어진 현실 이면을 드러냄으로써, 관련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고단한 삶과 자녀 살해 및 자살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환기하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별도의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이 직면한 질펀한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며,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Notes
장예지, 이우연, 박지영, 2022,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2023. 11. 20. 검색, https:// www.hani.co.kr/arti/society/soc iety_general/1049486.html
References
. (2005). 범죄분석통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1994~2005). 국가통계포털. 2024. 10. 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i=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TX_13501_A086%26orgId%3D135%26.
. (2023). 범죄분석통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국가통계포털. 2024. 10. 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38&conn_path=I3.
. (2021. 5. 5). 40대 엄마, 발달장애 자녀 두고 죽음 택해.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19578 .
, , . (2022. 7. 4).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더인디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486.html .
. (2024).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나선다. 정책주간지 K-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0222000000&news_id=e28487d3-7066-47c1-a262-2d8c8cccadfc .
. (2020. 12. 22). ‘돌봄 지옥’에 갇힌 부모, 자가격리에도 ‘발달장애인 자녀’ 돌본다.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8 .
. (2024. 10. 8). 뉴스검색·분석. www.bigkinds.or.kr .
, , , & (2019). Injury-related healthcare use and risk of filicide victimization :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Psychiatry & Behavioral Science, 64(1), 166-171. [PubMed]
, & (2012). Filicide-Suicide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Neurology, 28(6), 745-751. [PubMed]
, , & (2005). Child murder by mothers: a cri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and a research agend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9), 1578-1587. [PubMed]
, & (1994). Murder-suicide in Fulton county, Georgia 1988–1991: comparison with a recent report and proposed typ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15(2), 168-173. [PubMed]
, , , , & (2020).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Bangladeshi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comparative stud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101994. [PubMed]
, , , , , , & (2021). Familicid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rauma, Violence, Abuse, 22(1), 83-98. [PubMed]
(2016). Understanding homicide–suicide. Psychiatric Clinics, 39(4), 633-647. [PubMed]
, , , & (2007). Homicide–suicide—an event hard to prevent and separate from homicide or suicid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66(2-3), 204-208. [PubMed]
, , , , & (1999). Paternal filicide: A study of 10 men.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4(1), 57-63.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4-10-31
- 수정일Revised Date
- 2025-03-14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03-17

- 784Download
- 1512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