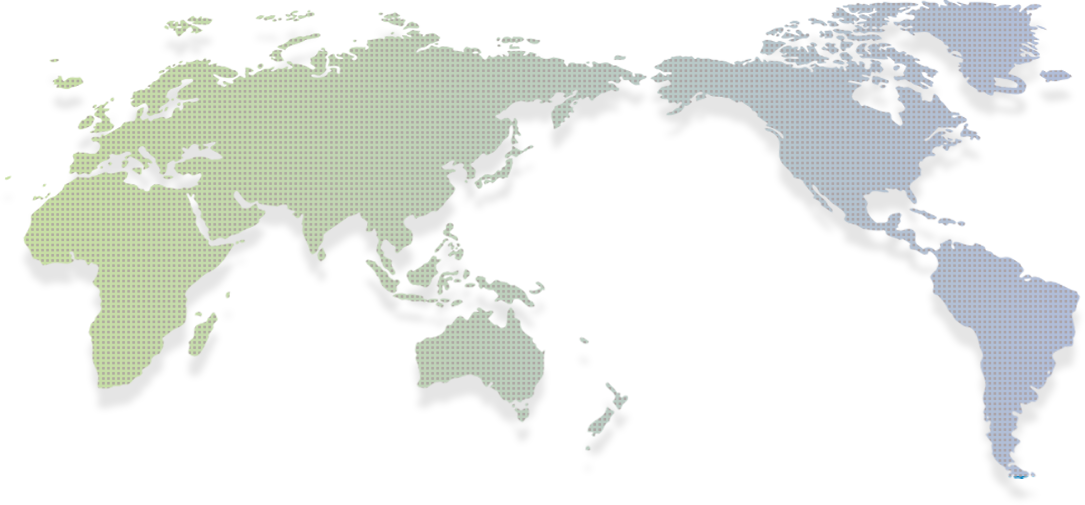

러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네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대만

이탈리아

폴란드

인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 권호에 11개 논문이 있습니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recent trends and issues in Canadian Employment Insurance (EI) and the measures implemented to promot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those receiving EI benefits. Although EI is a federal program, it is designed so that its benefit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duration of eligibility vary with the region of residence. A distinctive feature of Canada’s EI program is that its benefits are linked to the regional unemployment rate. However, a social insurance scheme of such a design is liable to render “cross-subsidization” unfair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In this connection, the Canadi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activation policy in 2012, with the target population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patterns of benefit receipt. With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programs making up a growing part of EI in Canada as elsewhere, calls are growing for moving beyond short-term makeshift measures toward a from-the-ground-up reform of EI financing.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고용보험 급여 및 수급자 대상 활성화 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캐나다 고용보험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실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역 실업률과 실업급여가 연계된 것은 캐나다 고용보험의 특징이다. 이런 제도적 특징은 지역 간, 산업 간 불공평한 상호보조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2년부터 수급 경험에 따라 수급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활성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모성휴가, 육아휴직 프로그램이 고용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재원 조달 방식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German Basic Income Support for Jobseekers is administered under its eponymous law (Book II of the Socia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5. Implemented as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upport scheme aims to promote gainful employment among unemployed and low-income peopl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s 15 to 67), providing them with tailored career guidance and job placement services and, with Arbeitslosengeld II replacing the unemployment allowance and social assistance of earlier days, also safeguarding recipients’ basic standard of living. Arbeitslosengeld II was renamed Bürgergeld in 2023, with eligibility requirements eased and the focus shifting toward supporting jobseekers and low-income earners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ir work competencies so that, over the medium-to-long-term, they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the labor market and earn a living on their own.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은 2005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사회법전 제2권)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67세 미만)에 속하는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해 기존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에 실업급여2(Arbeitslosengeld2) 제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강화하고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1) 실업급여2는 2023년도부터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개칭되면서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스스로의 근로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자의 직업 수행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The French reform of unemployment insurance, initiated in 2017, is ongoing as of 2025. Of the many changes made to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 focus on the measures aimed at transitioning jobseekers into work. A subtle shift has taken place in the activation policy. The policy since its enactment in November 2019 has imposed stricter regulations 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creased controls on jobseekers, while also expanding in scope and target population in 2023. Since then, the France Employment Agency (France Travail)—formerly the National Center for Employment (Pôle Emploi)—has managed not only general jobseekers but also youth lacking job-ready competencies and recipients of Earned Income Supplement, helping these group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rough engagement contracts (contrat d’engagement).
2017년 시작된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 개혁은 2025년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양한 변화 중 이 글에서는 구직자의 활성화 조치를 중심으로 프랑스 실업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활성화 정책의 미세한 방향 전환을 발견하였다. 2019년 11월 시행령 공표 이후 실업보험 관련 규칙이 엄격해졌고 구직자에 대한 통제가 강해졌다면, 2023년 이후에는 활성화 정책의 범위와 정책 대상이 확대했다. 다시 말해 활성화 정책의 실행 기관인 고용센터(현 프랑스노동)가 2023년 이후 일반 구직자 이외에도 취업 능력이 약한 청년세대와 기초생활(RSA)수급자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형태로 이들에게 여러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The article concerns Sweden’s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A longstanding champion of the Ghent model, which incorporates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state-led labor market interventions, Sweden had to make significant cuts to insurance coverage since the 1990s, in keeping with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retrenchment. As a result, unemployment insurance has developed into a multi-pillar system that includes a supplemental income insurance plan. Consequently, the percentage of jobseeker’s allowance claimants has increased. Meanwhile, the focu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ifted away from labor market integration toward promoting job-seeking activities, gradually aligning with market mechanisms, with reform underway geared toward privatizing public employment services. Despite Sweden’s unemployment rate nearing 10 percent this yea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protecting the unemployed or improving active market polici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se ongoing changes on the protection and long-term labor market integration of unemployed individuals warrants further attention.
이 글은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변화 및 개혁 논의를 다룬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겐트모델 기반의 자발적 실업보험과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개입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재정 긴축으로 인해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은 보충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로 변화했으며, 동시에 실업부조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노동시장 통합보다 구직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추며 점진적으로 시장화되었고, 민간 사업자 중심의 공공고용서비스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실업률이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보호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러한 변화가 실업자 보호와 장기적 노동시장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rticle 2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that disable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the opportunity to gain a living by work freely chosen or accepted in a labor market and work environment that is open and inclusive.” Conforming to this provision, Korea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aimed at help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nter the general labor market. However, with facilities still scarce and available programs limited,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benefiting from vocational rehabilitation remains low. Meanwhile, Germany, where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s has been in place far longer than in Korea, has recently entered upon revamping the existing system, with a view to advancing social integration and mitigating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This article explores the features and details of the German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disabled person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근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한국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재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흡하여 직업재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한국보다 장애인 직업재활이 훨씬 앞서 발전한 독일의 경우 사회통합 실현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최근 장애인 직업재활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조명하고,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German cases of support for the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and discuss their significance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se cases include child-friendly policies implemented by Germa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by private organizations. The implications drawn for Korea can be summarized in three key points. First, the related legal frameworks must be amended to ensure continued exper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service delivery. Second, it is essential to put together manuals and skilled human resource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themselves in urban planning and related projects. Third, for the child-friendly city policies to prove effective, they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and assessment.
이 글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아동 친화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친화도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전문적,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이나 관련 사업에 아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구성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pansive in territory and relatively sparse in population, Australia has long faced disparities in healthcare access, service use, and quality of life between urban cities and remote rural area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helped develop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like the ASGS-RA and the Monash Model and put them to use i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scope, and levels of government support. Various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employ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IT-assisted remote services, and integrated healthcare, caregiving, and social services, all aimed at better assisting areas that lack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Australia’s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tailored support policy, and service provision methods could offer valuable lessons for Korea—where the circumstances are such that with populations declining in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ities,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potential extinction of non-urban areas—to improve access to health and caregiving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ensure a standard quality of life for all res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에서 거리가 먼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ASGS-RA와 모내시 모델과 같은 지리적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 지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정부 지원의 범위와 수준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터브 지원, 보건의료・돌봄・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리적 통계 분류 체계와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방식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in 2011 of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regular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o capture the living conditions of homeless people, but with concerns persisting about the under-sampling of women. This article reviews surveys conducted in the UK, Canada, and the US on homeless women and draws less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The UK case involves a census aimed at measu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women sleeping rough. The Canadian survey is of the state of women’s housing and homelessness. The example from the US is a survey of the needs of homeless women in Los Angeles. These surveys, while varying in approach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contexts of each country, share the common goal of bringing visibility to homeless women and informing policymakers of their needs. The emphasis throughout is on the need for linking policy interventions with more flexible approaches that go beyond traditional survey methods to reveal the realities faced by homeless women.
한국에서는 2011년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홈리스 여성이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영국과 캐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홈리스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한국의 홈리스 여성 실태 파악에 참조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거리 노숙 여성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스, 캐나다에서는 여성의 주거와 홈리스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홈리스 여성의 욕구 사정 조사가 각각 시행되었다. 이들 조사는 각 국가의 특성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도 홈리스 여성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여성들의 실제 삶에 다가가려는 유연한 접근과 조사와 정책 개입 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