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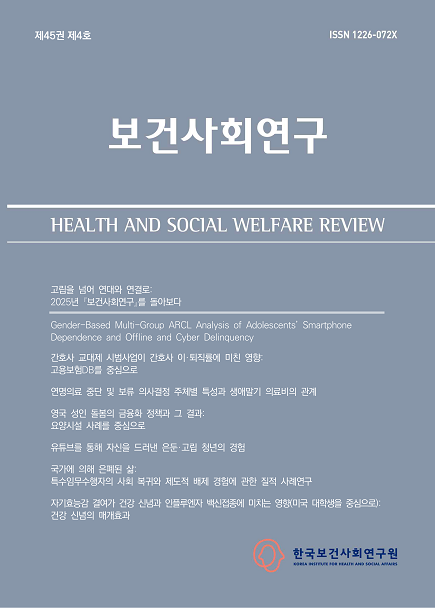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in Later Life: An Age-dependent Analysis
Choi, Eun Young; Cho, Sung Eun; Oh, Young Sam*; Chang, Hee Su; Kim, Young Sun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181-215,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18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ge (whether one subjectively perceives himself as ‘the elderly’ or ‘not the elderly’) and healthy ag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Elderly Survey (KIHASA),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653 participants consisting of young-olds (aged 65-74) and old-olds (aged 75-84) For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In the young-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fewer chronic diseases, lower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social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old-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and not with the other domains of healthy ag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age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adults’ healthy ag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has a differ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ge group.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스스로를 노인 혹은 비(非)노인으로 인지하는지 여부)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령집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 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령노인인 경우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을 제외하고 건강노화의 다른 세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의 새로운 고려 요소로 제시하여, 두 요소의 관련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구별된 집단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연관성이 연령집단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Ⅰ. 서론
기존의 노화관련 연구에서 인간의 노화정도는 일반적으로 역연령(chronological ag e)1)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되어 왔다(정주원, 조소연, 2013). 역연령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측면에서 노인학 및 사회제도영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정경희, 2011; 임안나, 박영숙, 2015). 하지만 노인의 노화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역연령 지표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역연령 지표는 노인의 노화정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old age)”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과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던 신체적 기능 감퇴 현상은 현대에 들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이윤경, 정경희, 염지혜, 오영희, 유혜영, 이은진의 연구(2010)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ADL과 IADL 수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정상 노인의 비율이 1994년 49.7%에서 2008년 81.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한다면, 역연령 지표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둘째, 한국의 상황에서 역연령 지표는 측정 과정에서 오염(bias)이 생길 여지가 있는 데, 이는 한국의 복잡한 나이 체계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나이’는 출생 시점 이후 살아온 햇수를 뜻하는 개념의 ‘역연령’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먹고 출생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 개념의 ‘세는 나이’를 일컫는다. 때문에 ‘세는 나이’는 동일하더라도, 실제 역연령에서 최대 360일의 괴리(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노인 세대의 경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신동호, 2015). 이에 노인들 중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호적 나이)’와 실제 출생 시점을 기반으로 한 ‘역연령’이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역연령’으로 노인의 노화를 측정할 경우 오염(bias)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역연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2) 을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Kotter-Gruhn, Kornadt, & Stephan, 2015). 주관적 연령이란 개인의 연령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의미하는데 (Westerhof & Tulle, 2007; Diehl et al., 2014),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노화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다(Montepare, 2009). 노화란 자신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의 변화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자아정체성(self identity)에 대한 인지적인 표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인 것이다(Westerhof & Wurm, 2015). 이 과정에 따라 인간은 역연령에 따라 노화를 동질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상이한, 다시 말해 주관적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Miche, Wahl, Diehl, Oswald, Kaspar, & Kolb, 2014).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healthy aging)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인간의 노화를 건강노화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건강노화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Hsu, 2007). 다시 말해, 정상적인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이다(한가영, 오영삼, 김영선, 2016). 이 때, 주관적 연령은 건강노화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altes & Smith, 2003).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관적 연령은 자아개념(self-concept)의 일환으로(Erikson, 1998; Keyes & Westerhof, 2012; 정주원, 조소연, 2013), 이른 청소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과정 속에서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 건강 유지(health maintenance), 자아규제(self-regulation) 등 개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Montepare & Lachman, 1989). 특히 노년기에 젊은 주관적 연령을 보유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건강한 노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Taylor & Brown, 1988; Stephan, Sutin, & Terracciano, 2015). 기존의 실증연구는 이러한 논리를 지지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젊다고 느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Keyes & Westerhof, 2012), 활발한 사회활동(Baltes & Smith, 2003; Sneed & Whitbourne, 2005), 좋은 인지기능 및 신체적 건강(Spuling, Miche, Wurm, & Wahl, 2013; Stephan, Caudroit, Jaconelli, & Terracciano, 2014)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관적 연령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건강노화의 예측요인으로써 주관적 연령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주관적 연령과 노인의 건강노화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에 대한 분석(장휘숙, 2010; 김미령, 2013; 정주원, 조소연, 2013)을 시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들의 연구에서 건강노화는 주로 단일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련성이 노인의 연령별 집단(연소, 고령노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마다 주관적 연령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건강노화를 인지, 신체, 정신, 사회적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연령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나아가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모형 검증 이전에 주관적 연령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통일성 없이 산재되어 있던 주관적 연령의 개념과 측정방식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노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실천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써 노화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연령에 대한 국외문헌고찰
기존의 연구에서 주관적 연령의 정의는 “연령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써, 연구마다 크게 다르지 않게 쓰이고 있다(Bowling, See-Tai, Fbrahim, Gabriel, & Solanki, 2005; Westerhof, 2008). 그러나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Westerhof et al., 2014),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 첫째는 주관적 연령을 다차원 하위문항으로 측정한 뒤,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느끼는 연령(feel age), 보이는 연령(look age), 행동 연령(do age) 관심사 연령(interest age)의 총 4가지 차원에서 주관 적으로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Barak & Stern, 1986).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관적 연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하위차원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leinspehn-Ammerlahn, Kotter-Grühn, & Smith, 2008).
두 번째 방법은 대상자에게 느끼는 연령(feel age)에 관한 단일문항(“몇 살이라고 느끼 십니까?”)을 통하여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다(Kotter-Grühn, Kornadt, & Stephan, 2015). 일각에서는 주관적 연령 개념이 가지는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단일 문항(unidimensional construct)을 이용한 측정방식은 노화 과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Diehl et al., 2014; Barrett & Montepare, 2015). 하지만 이 측정방식은 간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에서 주관적 연령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Kornadt, Meissner, & Rothermund, 2016).
세 번째는 느끼는 연령(feel age)에 관한 단일문항과 역연령의 차이 값을 활용한 측정 방법이다(Mock & Eibach, 2011). 앞선 두 번째 방식에서 사용한 단일문항을 동일하게 이용하지만 결과 값(주관적 연령)을 계산할 때 응답한 원 값(raw scores)을 그대로 이용 하지 않고, 원 값에서 응답자의 역연령을 뺀 값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느끼는 연령(felt age)에서 역연령을 뺀 값이 양수이면 실제 나이보다 늙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이면 그 반대이다. 이 측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령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인 역연령을 동시에 사용하여 변인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느끼는 연령(feel age)은 65세로 동등하지만, 그들의 역연령이 각각 50세와 70세라면 이 지표를 통해 +15(역연령에 비해 늙음)와 -5(역연령에 비해 젊음)로 구분되어진다.
네 번째 방법은 차이 값이 아닌 비율 차이 값(proportional discrepancy scores)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비율 차이 값은 느끼는 연령(felt age)에서 역연령을 뺀 후, 다시 그 값을 역연령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예를 들어 70살이라고 느끼는 90살(역연령) 노인의 경우, 자신의 연령보다 22%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는 것이다([70-90]/90=-.22). 이 같은 측정방식은 차이 값이 연령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고안되었다. 앞서 예시로 든 70살이라고 느끼는 90살과 30살이라고 느끼는 50살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두 경우 차이 값은 20살로 동일하지만, 90살은 자신의 연령보다 22%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는 반면, 50살은 자기 나이에 비해 40%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고 있다([30-50]/50=-.4). 비율 차이 값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해준 다. 그 외에 “노후가 몇 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는 노인시작연령(perceived old age)의 개념 및 방식도 존재한다(Kaufman & Elder, 2002).
2. 주관적 연령에 대한 국내동향
국내에서도 노년기 주관적 연령을 연구의 주요변인으로 살펴본 연구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주제마다 주관적 연령의 개념을 상이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측정도구도 제안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념에 있어서는 주관적 노후인식, 노후연령인지, 주관적 연령, 지각연령 등 다양한 유사 개념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형 검증에 앞서, 주관적 연령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동향 분석에 이용된 논문은 총 24편이며, 이들 연구들은 2000년 이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연령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연령은 크게 인지 연령, 노인시작연령, 주관적 노후인식, 그리고 차이연령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관적 연령 개념(용어) 및 측정 방식에 따른 분류
| 개념(용어) | 측정방식 | 코딩방식 | 저자(연도) |
|---|---|---|---|
| 인지연령: 스스로가 인지 또는 지각하는 연령, 다차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 |||
| 인지연령 | ‘나는 몸과 마음이 나이보다 젊은 편이다’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 | 범주(5점 척도) | 부경희(2005) |
| 주관적 연령 |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윤유경, 1996)가 수정 | 범주(10-80대) | 백진호(2005) |
| 주관적 연령지각 |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윤유경, 1996) | 범주(10-80대) | 백순기 등(2007) |
| 지각연령 |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윤유경, 1996) | 범주(30-80대) | 김정실, 이선재(2008) |
| 지각연령 |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윤유경, 1996) | 범주(30-80대) | 정문미(2012) |
| 인지연령 | 인지연령 척도(Barak & Schiffman, 1981)나 | 범주(30-80대) | 오찬옥(2015, 2016) |
| 노인시작연령: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령, 단일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 |||
| 노년기시기 |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 묻는 문항 | 범주(55세~85세) | 이금룡(2005) |
| 노년시작인식연령 |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몇 세 정도입니까?” | 범주 (60세미만~85세이상) | 김정석, 김송은(2012) |
| 노후연령인지 | “몇 살부터 노후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속변수 | 김미령(2015b) |
| 노년기시작연령 | “몇 세부터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속변수 | 임안나, 방영숙(2015) |
| 주관적 노후인식: 개인 스스로를 노후 또는 비노후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단일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 |||
| 노인 자가인지 | 스스로 노인이라고 느끼게 된 계기 | 범주(노인/비노인) | 이금룡(2005) |
| 주관적 노후인식 | 현재 자신을 노후라고 인식하는지 여부 | 범주(노후/비노후) | 정주원, 송현주(2012) |
| 노후연령인식 | 스스로 노후연령시기라고 인식하는지 여부 | 범주(노후/비노후) | 김미령(2013) |
| 주관적 노후인식 |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시작 연령을 기준했을 때, 자신이 노후시기에 진입했는지 여부 | 범주(노후/비노후) | 정주원, 조소연(2013) |
| 주관적 노후인식 | “현재 귀하는 노후시기에 해당하십니까?” | 범주(노후/비노후) | 김혜진(2016) |
| 차이연령: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젊게 혹은 늙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 역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 | |||
| 인지연령 | 인지연령 척도(Barak & Schiffman, 1981) | 범주(30~80대) | 이금룡(2008) |
| 차이연령 | 역연령-인지연령 | 연속변수 | |
| 주관적 연령 | 인지연령 척도(Barak & Schiffman, 1981) | 범주(5점 척도) | 강은미, 박은주(2009) |
| 차이연령 | 실제 연령 - 주관적 연령 | 연속변수 | |
| 차이인지 |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산다고 생각하는가?” | 범주(예/아니오) | 조경섭, 김은희(2009) |
| 인지연령 | “남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나이?” | 연속변수 | |
| 차이연령 | 인지연령-역연령 | 연속변수 | |
| 인지연령 | 인지연령 척도(Barak & Schiffman, 1981) | 범주(10~80대) | 김현정, 최기탁(2010) |
| 차이연령 | 실제연령-인지연령 | 연속변수 | |
| 주관적 연령 | 실제 연령보다 ‘더 젊다/그대로다/더 늙었다’ | 범주(낮은/동일/높은) | 장휘숙(2010) |
| 인지된 연령 | “스스로 느끼시는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연속변수 | 홍경희, 이윤정(2010) |
| 차이연령 | 인지된 연령-실제 연령 | 범주(연소/평균/연로) | |
| 주관적 노후 | 노후 시작에 해당하는 연령 - 역연령 | 범주(노후/비노후) | 송현주, 김균희(2013) |
| 노후연령인지 | “몇 살부터 노후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속변수 | 김미령(2015a) |
| 차이연령 | 노후연령인지 - 역연령 | 연속변수 | |
| 연령정체성 | 역연령 - 노후연령인지 | 범주(노인/젊은정체성) | 한지나(2015) |
가: Montepare와 Lachman(1989) 개발한 척도를 윤유경(1996)이 국내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로, 느끼는 연령(feel age), 보이는 연령(look age), 관심사 연령(interest age), 활동 연령(do age) 네 차원에서 각 5문항씩 총 20문항의 질문지 구성
나: Barak과 Schiffman(1981)이 개발한 척도로, 느끼는 연령(feel age), 보이는 연령(look age), 관심사 연령(interest age), 활동 연령(do age) 네 차원에서 각 단일 문항으로 총 4문항의 질문지 구성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인지연령(self-perceived age)을 통하여 주관적 연령을 검증하였다. 인지연령이란 스스로가 인지 또는 지각하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다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척도는 Montepare와 Lachman(1989)이 개발한 척도를 윤유경(1996)이 국내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이다. 주관적 연령지각척도에서는 느끼는 연령, 보이는 연령, 관심연령, 활동연령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 측정방식은 주관적 연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하위개념 간의 불일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노인시작연령(perceived old age)이다. 노인시작연령이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령을 의미하며, 측정에는 보통 단일척도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이금룡, 2005), “귀하는 몇 세부터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임안나, 방영숙, 2015) 등의 질문이 사용된다. 이 측정방식의 한계는 대상자 본인의 노인시작연령보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시작 연령을 질문하였다는데 있다. 즉, 스스로의 노년기 시작연령이 아닌 전체 인구의 노년기 시작연령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연령이 완벽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다.
셋째는 노인시작연령보다 개인의 주관적 노년에 더 초점을 둔 주관적 노후인식(subjective old-age perception)이다. 주관적 노후인식은 사회적 노년 시작 시기가 아닌 개인 스스로를 노후 또는 비노후라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주로 “현재 귀하는 노후 시기에 해당하십니까?”(김혜진, 2016) 등의 단일 문항이 이용된다. 앞서 언급한 노인시 작연령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주관적 노인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년시작 연령과 같은 연속(continuous)변수가 아니라, 노후 여부를 묻는 이분(dichotomous)변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양이 적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차이연령(discrepancy age)이 주관적 연령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차이연령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젊게 혹은 늙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연령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박광희, 2012). 개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차이연령은 주관적 노후인식과 유사하지만, 측정 방법에 있어 역연령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차이연령은 개인의 역연령에서 인지연령(혹은 반대)을 뺀 값을 계산(type1)하거나(이금룡, 2008; 조경섭, 김은희, 2008; 강은미, 박은주, 2009) 혹은 역연령과 노인시 작연령의 차이(type2)를 통해 측정된다(송현주, 김균희, 2013; 김미령, 2015a; 한지나,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측정 방식 가운데 차이 연령의 type2를 통해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였다. Type2 차이연령은 노인시작연령과 역연령을 모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의 시작과 자신의 나이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기준에서 자신의 연령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건강노화(healthy aging)3)란 특정 질병이나 장애에 따른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인지 및 신체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늙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권인순, 2007). Rowe와 Kahn(1997)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낮은 질병 발생률과 높은 인지 및 신체적 기능,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를 지속적인 사회적 참여를 포함하는 건강 노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체적 쇠퇴를 의미하는 정상노화(normal aging)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89), 정상노화과정에 노화 관련 질환이 동반되는 일반 노화(usual aging)의 개념(Troen, 2003)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노화 개념에 입각하여, 노화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건강노화에 대한 리뷰 논문 결과(Peel, Bartlett, & McClure, 2004)에 의하면, 건강노화의 영역은 대체로 신체적(physical functioning), 정신적(mental well-being), 인지적(mental functioning), 그리고 사회적 건강(social functioning)으로 측정되어왔다. 대표적으로 Garfein(1995) 는 건강노화를 신체적 기능, 인지적 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 참여 각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Vaillant(2001)은 건강노화를 객관적 신체적 건강, 주관적 신체적 건강, 인지 건강, 활동적 삶, 삶의 만족,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Von Faber(2001)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안녕감 전반에 걸친 최적의 상태를 건강노화라고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강노화를 인지, 신체, 정신적으로 높은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활동도 지속하며 늙어가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주관적 연령은 건강노화 각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건강 노화의 구성 요소 중 인지 기능은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주관적 연령은 노년기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Stephan, Caudroit, Jaconelli, Terracciano(2014)은 장기 종단 연구에서 젊은 주관적 연령을 소유한 사람이 10년 후에 더 좋은 일화 기억력과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연령이 역연령보다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기억을 회상하는 능력이 더 좋고, 4년 간 추적한 결과, 기억력 감퇴가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Stephan, Sutin, Caudroit, & Terracciano, 2016).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주관적 연령이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Demakakos, Gjonca, Nazroo(2007)의 장기 종단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연령이 젊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self-perceived health)가 좋게 나타났으며, 이후에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받을 확률이 더 낮았다. 또한 젊은 주관적 연령을 보유한 사람은 질병의 수가 적었으며, 기능적 건강상태가 더 좋게 나타났다(Spuling, Miche, Wurm, & Wahl, 2013). 이와 유사하게, 국내연구에서도 주관적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주관적 건강이 더 좋았으며, 질병 비율도 더 낮다는 점이 밝혀졌다(장휘숙, 2010; 김미령, 2013). 한편, 더 나아가서 주관적 연령이 노년기 사망률 혹은 장수확률까지 예측한다는 선행연구결과도 존재한다(Markides & Pappas, 1982; Uotinen, Rantane, & Suutama, 2005).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연령은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 Keyes와 Westerhof (2012)는 젊은 주관적 연령은 늙은 주관적 연령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장휘숙(2010)은 늙은 주관적 연령을 지닌 집단에서는 심한 우울로 분류된 사람들이 높은 반면, 젊은 주관적 연령을 지닌 집단에선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정주원, 조소연(2013) 의 연구 역시 주관적으로 자신을 노후라고 여기는 노인은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높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건강과 주관적 연령은 밀접한 연관을 지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활동은 감소하게 된다(Carstensen, 1991). 이는 노인연령이 되면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김정석, 김송은, 2012; 하정화, 정은경, 정은석, 2015). 하지만 최근,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 연령에 접어들더라도 젊은 연령을 보유하는 경우, 사회 활동은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여지가 높다(Baltes & Smith, 2003; Sneed & Whitbourne, 2005).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주관적 연령은 역연령을 통제하고도, 혹은 역연령보다도 더 밀접하게 건강노화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와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연령대별로 구분지어 살펴본 연구는 없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자로 하거나, 특정 연령대(60대 등)만 선정하는 등 연령대에 따른 비교없이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취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연소노인(65-74세), 고령노인(75-84세), 초고령노인(85세 이상) 연령집단별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인지‧정신적 요인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전해숙, 강상경, 2012), 노인 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으로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주관적 연령이 건강 노화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노인의 건강노화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A, B.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노인”인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좋은 인지기능을 가질 것이다.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노인정 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노인실태조사의 2014년 자료는 전국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목표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4년 6월~9월 기간 동안 각 조사구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 조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총 완료된 조사구는 975개이며, 노인 수는 10,451명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N=10,451), 만 65세~84세인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85세 이상 노인을 배제한 이유는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 상태를 파악한다는 연구의 주목적에 근거한다. 이는 본 연구의 의의가 연구대상자 내에서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노인집단과 노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非)노인집단 간의 이질성이 드러날 때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전 분석결과, 만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서는 “노인” 98.8%, “비(非)노인” 1.2%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집단에 해당하여 이질성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만 65세~74세 연소노인의 경우 “노인” 41%, “비(非)노인” 59%, 만 75세~84세 고령노인의 경우 “노 인”88.2%, “비(非)노인”11.6%로 분석에 적절한 특성을 보였다. 노년기 주관적 연령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분석 대상 노인을 일정 연령에 따라 한정하고 있다(정주원, 송현주, 2012; 정주원, 조소연, 2013). 이후 목록별 결측치 제거 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총 9,653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선정되었다.
3.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주관적 연령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관적 연령으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다음의 두 항목을 계산에 이용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노인시작연령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두 번째 항목은 응답자의 역연령(만나이)이다. 주관적 연령은 첫 번째 항목(노인시작연령)에서 두 번째 항목(응답자의 역연령)을 뺀 값으로 측정되었다. 두 항목을 계산한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본인의 역연령이 일반적 노인시작연령을 넘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주관적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결과값이 0인 경우, 본인의 역연령이 일반적 노인시작연령에 도달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역시 “주관적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결과값이 양수인 경우, 본인의 역연령이 일반적 노인시작연령보다 적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주관적 비(非)노인”으로 구분4)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종 형성된 변수에 대해 각각 주관적 노인 =1, 주관적 비(非)노인=0값을 부여하였다.
나. 종속변인: 건강노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건강노화로, 인지건강,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건강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지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점수가 사용되었다. MMSE-DS는 시간 및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기억 회상, 주의 집중, 언어 능력, 시공간능력, 판단력 등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MMSE-DS 점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상태에 대한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35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건강노화 선행연구에서 만성질환 수나 기능제한여부로 흔히 측정된다(Peel, Bartlett, & McClure,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측정을 위해 만성질환 수를 이용하였으며, 기능제한여부는 인지, 정신, 사회적 건강에 전반에 걸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Mehta, Yaffe, & Covinsky, 2002),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때, 만성질환 수는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의 개수를 의미하며, 본 자료에서 0개~15개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변수의 정규화를 위해 5개 이상에서 Top-coding을 실시하였다(Cohen et al., 2002). 정신건강은 우울정도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척도는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이다. 총 문항은 15개로, 모두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0점~15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우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0.903(KR=20 coefficient)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활동 참여를 변수 구성에 이용하였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사회활동을 학습활동,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각 사회활동의 참여여부를 비참여=0, 참여=1으로 코딩하였다. 이어서, 각 사회활동의 참여빈도를 0=안 함, 1=월 1회 미만, 2=월 1회, 3=2주 1회, 4=주 1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두 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최종 사회활동 참여로 구성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변수의 구성
| 변수 | 측정방식 | |
|---|---|---|
| 독립변수 | 주관적 연령 | 주관적 노인=1, 주관적 비(非)노인=0 |
| 종속변수 | 인지기능 |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척도 점수 (범위: 0-30점) |
| 만성질환 수 | 없음=0, 1개=1, ~ 5개 이상=5 | |
| 우울 |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 점수 (범위: 0-15점) | |
| 사회활동 참여 | 사회활동가의 참여여부 * 참여빈도의 합 (범위: 0-20점) | |
| 통제변수 | 역연령 | 만 연령 (65세 ~ 84세) |
| 성별 | 여자=1, 남자=0 | |
| 배우자유무 | 유배우자(생존 배우자 있음)=1, 무배우자(이혼/별거/사별/미혼)=0 | |
| 교육수준 | 무학(글자모름)=1 무학(글자해독)=2, 초등=3, 중학=4, 고등=5, 전문대 이상=6 | |
| 취업여부 | 취업=1, 미취업=0 | |
| 경제수준 | 연간 가구소득나 기준 1분위~5분위=1~5 | |
| 종교유무 | 있음=1, 없음=0 | |
| 기능제한여부 | 제한=1(ADL 7개 및 IADL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비제한=0 |
4. 분석방법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연령집단 및 주관적 연령별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카이자승(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연령집단별로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인지기능, 만성질환 수, 우울, 사회활동 참여)의 비교분석을 위해 t-test와 카이자승(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가정 검증을 먼저 실시한 결과,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연속 변수는 정상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P-P도표에서 회귀표준화 잔차들은 직선에 가깝게 산재되었고, 산점도에서는 잔차의 이분산성이 보이지 않아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있었다. 이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Dubin-Watson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최소값이 1.555, 최대값이 1.861로 나타나 모든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승변령(VIF)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값이 최소 1.06에서 최대 1.60로 나타나 모든 모형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령집단 및 주관적 연령별 일반적 특성 비교
조사대상자의 연령집단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노인이 각 연령집단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영선, 2012; 이현주, 2013). 특히 주관적 연령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노인 중 자신을 “비(非)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3%(3,260명)로,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연소노인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고령노인 중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8.1%(3,315명)으로, 자신을 “비(非)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세하게 많아 연소노인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표 3
연령집단 및 주관적 연령별 일반적 특성 비교
| 변인 | 연소노인(n=5,891) | 고령노인(n=3,762) | 유의성 검증 | |||||
|---|---|---|---|---|---|---|---|---|
|
|
|
|||||||
| 주관적 연령 (노인) | 주관적 연령 (비노인) | 유의성 검증 | 주관적 연령 (노인) | 주관적 연령 (비노인) | 유의성 검증 | |||
|
|
|
|
||||||
| n(%)/평균(sd) | n(%)/평균(sd) | X2 /t-test | n(%)/평균(sd) | n(%)/평균(sd) | X2 /t-test | X2 /t-test | ||
|
|
||||||||
| 주관적 연령 | 노인 | 2,631(44.7%) | - | - | 3,315(88.1%) | - | - | 1832.89*** |
|
|
|
|||||||
| 비노인 | - | 3,260(55.3%) | - | 447(11.9%) | ||||
|
|
||||||||
| 성별 | 남성 | 1,052(41.7%) | 1,473(58.3%) | 16.07*** | 1,261(86.4%) | 199(13.6%) | 6.96* | 15.56*** |
|
|
|
|||||||
| 여성 | 1,579(46.9%) | 1,787(53.1%) | 2,054(89.2%) | 248(10.8%) | ||||
|
|
||||||||
| 배우자유무 | 무 | 879(48.4%) | 826(51.6%) | 46.13*** | 1,598(89.8%) | 181(10.2%) | 9.40** | 335.02*** |
|
|
|
|||||||
| 유 | 1,752(41.9%) | 2,434(58.1%) | 1,717(86.6%) | 266(13.4%) | ||||
|
|
||||||||
| 취업 | 미취업 | 1,672(46.3%) | 1,939(53.7%) | 10.17** | 2,502(89.0%) | 308(11.0%) | 9.00** | 185.03*** |
|
|
|
|||||||
| 취업중 | 959(42.1%) | 1,321(57.9%) | 813(85.4%) | 139(14.6%) | ||||
|
|
||||||||
| 종교 | 무 | 913(45.6%) | 1,091(54.4%) | .99 | 1,219(90.1%) | 134(9.9%) | 7.90** | 3.84 |
|
|
|
|||||||
| 유 | 1,718(44.2%) | 2,169(55.8%) | 2,096(87.0%) | 313(13.0%) | ||||
|
|
||||||||
| 교육수준 | 3.22(1.30) | 3.60(1.30) | 10.90*** | 2.87(1.39) | 3.05(1.35) | 2.56* | -19.31*** | |
|
|
||||||||
| 경제수준 | 2.89(1.35) | 3.32(1.31) | 12.43*** | 2.57(1.39) | 2.63(1.31) | .84 | -19.38*** |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연령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 또한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노인”과 “주관적 비(非)노인” 집단별로 대상자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 중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비(非)노인”은 “주관적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어서 고령노인에서 “주관적 노인”과 “주관적 비(非)노인” 집단별 대상자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연소노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소노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종교변수의 경우, 고령노인에서는 “주관적 비(非)노인”이 “주관적 노인”에 비해 종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소노인에서 유의미하였던 경제수준은 고령노인의 “주관적 노인”과 “주관적 비(非)노인”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봤을 때,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은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며, 향후 주관적 연령에 대한 연구에서 두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연령집단에 따른 주관적 연령 특성
본 연구에서 연소노인의 주관적 연령 특성은 [그림 1]에, 고령노인의 주관적 연령 특성은 [그림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연령”과 “노인시작연령”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노인(A)의 역연령은 71.08세였으나 이들이 인지하는 노인시작연령은 67.05세였다. 대조적으로, 주관적 비(非)노인(B)의 경우, 역연령은 68.37세, 노인시작연령은 73.89세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노인에서는 주관적 노인(C)의 역연령은 78.7세, 노인시작연령은 70.81세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비노인(D)의 역연령은 77.22세, 노인시작연령은 80.59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의 주관적 연령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역연령의 높고 낮음의 정도보다 노인시작연령의 높고 낮음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집단과 고령집단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역연령 차이는 각각 2.69[71.08(A)-68.37(B]와 1.48[78.70(C)-77.22(D]세였으나, 집단별 노인시작연령은 각각 -5.94[67.96(A)-73.90(B]과 -9.78[70.81(C)-80.59(D]세였다. 이 결과는 연소 및 고령노인에 관계없이 노인과 비노인 집단 간의 노인시작연령의 차이(-5.94, -9.78)가 역연령 차이(2.69, 1.48)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즉, 역연령보다는 노인시작연령(몇 살부터 노인이 되느냐)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주관적 연령(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여부) 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고령노인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노인과 비(非)노인 집단 간의 역연령 차이는 2.69세 이며, 노인시작연령의 차이는 5.94세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노인에서 두 집단의 역연령과 노인시작연령의 차이는 각각 1.48세와 9.78세였다. 이는 고령노인일수록 주관적 연령 형성에 있어, 역연령의 영향은 줄고, 노인시작연령의 영향은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연령집단별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 차이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본 분석에서는 건강노화 수준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지기능 점수와 우울 점수를 각 분류 기준점에 따라 나눈 인지저하 및 우울여부를 분석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6). 먼저 연소노인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연령에 따라 건강노화의 모든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자신을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인지기능과 사회활동 참여는 낮고, 만성질환 수와 우울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지저하와 우울로 분류된 비율이 스스로를 노인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한편 고령노인집단의 경우, 주관적 연령에 따라 만성질환 수와 우울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 정도의 차이가 연소노인 집단에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표 4
연령집단별 주관적 연령에 따른 건강노화 차이
| 건강노화 | 연소노인(n=5,891) | 유의성 검증 | 고령노인(n=3,762) | 유의성 검증 | |||||
|---|---|---|---|---|---|---|---|---|---|
| 노인 | 비(非)노인 | 노인 | 비(非)노인 | ||||||
| n(%)/평균(sd) | n(%)/평균(sd) | X2 /t-test | n(%)/평균(sd) | n(%)/평균(sd) | X2 /t-test | ||||
| 인지기능 | 23.90 | 25.19 | 12.24*** | 21.99 | 24.00 | 9.67*** | |||
| 만성질환 수 | 2.60 | 2.17 | -10.86*** | 2.74 | 2.60 | -1.92 | |||
| 우울 | 5.34 | 4.16 | -10.16** | 6.22 | 5.38 | -3.84*** | |||
| 사회활동 참여 | 1.81 | 2.41 | 9.04*** | 1.30 | 1.81 | 4.17*** | |||
| 인지 저하 | 비저하 | 1,747(43.0%) | 2,319(57.0%) | 15.26*** | 2,162(86.1%) | 348(13.9%) | 28.31*** | ||
| 저하 | 884(48.4%) | 941(51.6%) | 1,15392.1%) | 99(7.9%) | |||||
| 우울 여부 | 비우울 | 1,361(39.9%) | 2,050(60.1%) | 74.31*** | 1,440(87.2%) | 211(12.8%) | 2.27 | ||
| 우울 | 1,270(51.2%) | 1,210(48.8%) | 1,875(88.8%) | 236(11.2%) | |||||
4. 연구모형 분석
연령집단별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우선 연령에 따른 구분없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경우, 주관적 연령은 건강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역연령은 인지건강과 사회적 건강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성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으로 노인 집단을 구분했을 경우, 각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연령의 경우, 연소노인에서는 전 모형에서 유의한 설명변수였으나(전체노인과 동일), 고령노인에서는 인지건강에서만 유의하였다. 반면 역연령의 경우, 고령 집단과 전체노인을 비교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소노인에서는 두 경우와 다르게 역연령이 인지건강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집단별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
| 연령집단 | 구분 | 인지 건강 (종속: 인지기능) | 신체적 건강 (종속: 만성질환 수) | 정신 건강 (종속: 우울) | 사회적 건강 (종속: 사회활동) |
|---|---|---|---|---|---|
| B(β) | B(β) | B(β) | B(β) | ||
| 전체노인 (n=9,653) | 주관적 연령 | -.54(-.06)*** | .25(.08)*** | .22(.02)* | -.20(-.04)*** |
| 역연령 | -.11(-.13)*** | .01(.02) | -.01(-.01) | -.02(-.04)** | |
| 성별 | -.71(-.08)*** | .40(.13)*** | -.26(-.03)** | .62(.12)*** | |
| 배우자유무 | .07(.01) | -.12(-.04)** | -.47(-.05)*** | .10(.02) | |
| 교육수준 | 1.19(.36)*** | -.07(-.06)*** | -.35(-.11)*** | .36(.20)*** | |
| 취업여부 | .15(.02) | -.30(-.09)*** | -.86(-.09)*** | -.16(-.03)* | |
| 경제수준 | .11(.04)** | -.05(-.05)*** | -.34(-.10)*** | .14(.08)*** | |
| 종교 | .40(.04)*** | .21(.07)*** | -.20(-.02)* | .28(.05)*** | |
| 기능제한여부 | -2.51(-.20)*** | .43(.10)*** | 1.70(.13)*** | -.35(-.05)*** | |
| 주관적 건강상태7) | - | - | -.189(-.41)*** | .29(.12)*** | |
| 인지기능8) | - | - | - | .06(.12)*** | |
| R2 (Adj. R2) | .34(.34) | .10(.10) | .33(.33) | .16(.16) | |
| F | 543.71*** | 118.95*** | 475.11*** | 171.23*** | |
| 연소노인 (n=5,891) | 주관적 연령 | -.44(-.06)*** | .27(.09)*** | .23(.03)* | -.20(-.04)** |
| 역연령 | -.06(-.05)*** | .01(.02) | -.02(-.01) | -.00(-.00) | |
| 성별 | -.56(-.07)*** | .38(.12)*** | -.32(-.04)** | .77(.15)*** | |
| 배우자유무 | -.00(.00) | -.11(-.03)* | -.63(-.06)*** | .11(.02) | |
| 교육수준 | 1.13(.37)*** | -.09(-.08)*** | -.35(-.10)*** | .40(.21)*** | |
| 취업여부 | .03(.00) | -.32(-.10)*** | -.84(-.09)*** | -.23(-.04)** | |
| 경제수준 | .18(.06)*** | -.06(-.05)*** | -.35(-.11)*** | .21(.11)*** | |
| 종교 | .34(.04)*** | .21(.06)*** | -.17(-.02) | .24(.04)*** | |
| 기능제한여부 | -2.44(-.18)*** | .51(.10)*** | 1.76(.12)*** | -.38(-.04)**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1.89(-.42)*** | .32(.12)*** | |
| 인지기능 | - | - | - | .06(.10)*** | |
| R2 (Adj. R2) | .28(.28) | .10(.10) | .32(.32) | .16(.15) | |
| F | 250.23*** | 73.37*** | 282.43*** | 97.71*** | |
| 고령노인 (n=3,762) | 주관적 연령 | -1.18(-.08)*** | .07(.02) | .16(.01) | -.21(-.03) |
| 역연령 | -.15(-.08)*** | -.01(-.03) | -.02(-.01) | -.03(-.04)* | |
| 성별 | -.94(-.09)*** | .46(.15)*** | -.10(-.01) | .31(.07)*** | |
| 배우자유무 | -.01(.00) | -.13(-.04)* | -.22(-.02) | .02(.00) | |
| 교육수준 | 1.30(.37)*** | -.02(.02) | -.37(-.11)*** | .29(.19)*** | |
| 취업여부 | .37(.03)* | -.25(-.07)*** | -.90(-09)*** | -.06(-.01) | |
| 경제수준 | .06(.02) | -.04(-.03)* | -.32(-.10)*** | .06(.04)* | |
| 종교 | .48(.05)** | .21(.07)*** | -.24(-.03) | .34(.07)*** | |
| 기능제한여부 | -2.46(-.22)*** | .40(.11)*** | 1.65(.15)*** | -.34(-.07)***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 | -1.89(-.40)*** | .24(.11)*** | |
| 인지기능 | - | - | - | .06(.14)*** | |
| R2 (Adj. R2) | .31(.31) | .08(.07) | .30(.30) | .13(.13) | |
| F | 187.85*** | 33.75*** | 160.33*** | 51.78*** |
분석결과를 통해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연소노인 집단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령이 역연령보다 그들의 다양한 영역의 건강을 더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연령 보다는 역연령이 그들의 건강을 설명하는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연령집단 간 주관적 연령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역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차이(7.89세)가 연소 집단(3.12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이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의 경과는 고령노인에게 주관적 연령에 대한 인식보다는 오히려 역연령(혹은 흘러간 시간)에 대한 인식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령노인 집단에서 주관적 연령에 대한 인식보다 역연령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건강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들의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연소노인 중 과반수 가량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의 기술통계에서 스스로를 비(非)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5%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기준에서 부여되는 노인이라는 지위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비(非)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고령노인의 기술통계에서는 스스로를 비(非)노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약 12%로 나타나, 연소노인집단에서 보였던 노인 정체성에 관한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관적 연령 혹은 스스로 인지하는 노인여부는 역연령보다는 노인 시작연령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연소노인보다는 고령노인집단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고령노인에서 주관적 노인과 주관적 비(非)노인 집단의 역연령의 평균차이는 1.48세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노인시작연령 차이는 9.78세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노인에서 두 집단 간의 역연령과 노인시작연령의 차이는 각각 2.69세와 5.94세였다. 이는 고령 및 연소노인 모두에서 주관적 노인과 비(非)노인을 구분하는 과정(주관적 연령=노인시작연령-역연령)에서 노인시작연령이 역연령보다 더 큰 역할을 하며, 나아가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연령 형성에서 있어서 노인시작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노인으로 인지할수록 건강하지 못한 노화 상태(낮은 인지기능, 많은 만성질환 수, 높은 우울,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스스로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Goffman, 1963) 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정체성은 본래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낙인찍어 의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여(Hamblin, 2014) 그들의 건강한 노화를 저해했을 것으로 고려된다.
넷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 연소노인의 경우 주관적 연령은 건강노화의 모든 차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서 주관적으로 비(非)노인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노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더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령노인에서는 건강노화 요소 중 인지건강만이 주관적 연령과 유의미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마도 고령노인의 경우, 주관적 연령이 건강에 미치는 다른 요인(성별, 경제, 가족관계 등)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지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주관적 연령 건강과의 관계를 단일적인 차원(육체 내지 정신적 건강)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관적 연령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연령이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주관적 연령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인지적 건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건강에 다차원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노인의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건강노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두지 않고, 연령대에 따라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노인이 세부 연령대에 따라 인구학적 요인 및 건강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김영선, 2012; 이현주, 2013)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연령을 주요 변수로 검증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노인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노인 집단내의 다양한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연구결과의 해석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로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소집단과 고령집단 간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체노인 또는 연소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관적 연령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고령노인집단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사라졌다. 이 결과는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가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짐을 밝히는 동시에, 고령노인의 신체적 건강(만성질환 수), 정신적 건강(우울), 사회적 건강(사회활동 참여)에 주관적 연령이 중요한 예측요인이 아님을 밝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현장에서 주관적 연령을 낮추기 위한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목표대상의 명확화 및 집중화를 위한 실천적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노인과 연소노인 집단에서 모두 주관적 연령은 다른 변인 및 역연령을 통제하고도 그들의 건강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이 질병과 장애등의 부정적 문제를 극복하고 가능한 최적의 건강상태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Busse, 1969)이 건강노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건강노화는 정부와 실천영역을 아우르는 노인문제와 관련된 집단이 달성해야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연령의 저하를 통한 건강노화를 증진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자가 비(非)노인, 즉 젊은 주관적 연령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되어 그들의 건강노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학교 등의 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혹은 음악 및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이른바 ‘젊게 살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인시작연령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시작연령의 평균은 약 71세로, 본 연구의 연소노인 가운데 55%, 그리고 고령노인 가운데 12%가 스스로를 비(非)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에 대한 법적 연령 기준인 만 65세(통계청,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준)가 노인을 규정하는 적절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역연령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노인연령기준(만 65세) 대신, 정책의 대상 영역에 따라 유연한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정경희, 2011),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 었던 주관적 연령(“몇 살이라고 느끼십니까?”)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질문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본 연구는 역연령과 노인시작연령(“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차이 척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사회적 기준에서 자신의 연령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주관적 연령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기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또한 주관적 연령 코딩이 범주형(노인 /비(非)노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자가 실제나이에 비해 자신을 주관적으로 얼마나 늙게, 혹은 젊게 지각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을 측정함에 있어, 만성질환 수를 단일 변인으로 활용 하였다. 비록 기존의 건강노화 연구에서 만성질환 수가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변수이지만(Peel, Bartlett, & McClure, 2004), 단일 지표로써의 한계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환관련 변인(입원일 수, 의료비 지출 등)이나 육체관련 변인(노쇠, 시력, 근력 등)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주관적 연령과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time effects)을 연구모형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 연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인지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결과의 해석은 횡단 연구가 가지는 단점(예: 인과적 추론의 위협)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를 검증한 모형에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영향을 통제(다층모형)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형(잠재성장 모형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Notes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은 주관적 연령정체성(subjective age identity)과 유사한 의미로, 선행연구에서 두 용어는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Westerhof & Wurm, 2015).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건강노화란 노년기 건강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혼용되어 왔다 (Peel et al., 2004). 그러나 성공(success)은 경제적인 성취, 자산 등 물질주의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어(Bowling, 1993), 건강노화(healthy aging)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Kendig et al., 2001).
인지기능의 경우 MMSE-DS 총점 30점 중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세 변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점수에 근거하여 그 기준점 이하인 경우에는 치매의심의 인지저하자로 분류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우울의 경우 SGDS 총점 15점 중 5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박훈섭 등, 2015).
연구모형이 각각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기에, 종속변수에 따라 다른 건강요인을 추가로 통제변수로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연관을 가지는 변수로 보고되어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장휘숙, 2010; 정주연, 조소연, 2013; Caetano et al., 2013).
References
, & (2003).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2), 123-135. [PubMed]
, & (1986). Subjective age correlates: A research note. The Gerontologist, 26(5), 571-578. [PubMed]
(1993). The concepts of successful and positive ageing. Family Practice, 10(4), 449-453. [PubMed]
, , & (2007). Age identity, age perceptions, and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14(1), 279-287. [PubMed]
, & (1997).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mechanisms of health declin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3), 298-311. [PubMed]
, & (1995).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2), 77-87. [PubMed]
, & (2012). Chronological and subjective age differences in flourishing mental health and major depressive episode. Aging & Mental Health, 16(1), 67-74. [PubMed]
, , & (2008). Self-perceptions of aging: Do subjective age and satisfaction with aging change during old ag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377-85. [PubMed]
, , & (2016). Implicit and explicit age stereotypes for specific life domains across the life span: Distinct patterns and age group difference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42(2), 195-211. [PubMed]
, , & (2015). Looking beyond chronological age: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study of subjective age. Gerontology, 62(1), 86-93. [PubMed]
, , , , , & (2014). Natural occurrence of subjective aging experienc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2), 174-187. [PubMed]
, & (2011). Aging attitudes moderate the effect of subjective age o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a 10-year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and Aging, 26(4), 979-986. [PubMed]
, & (1989). “You’re only as old as you feel”: self-perceptions of age, fears of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rom adolescence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4(1), 73-78. [PubMed]
, &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4811), 143-149. [PubMed]
, , , & (2014). Subjective age and cognitive functioning: A 10-year prospective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11), 1180-1187. [PubMed]
, , , & (2016). Subjective age and changes in memory in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1(4), 675-683. [PubMed]
, , & (2015). Subjective ag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10-year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83(2), 142-154. [PubMed]
, &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PubMed]
, , & (2005). Perceived age as a predictor of old age mortality: A 13-year prospective study. Age and Ageing, 34(4), 368-372. [PubMed]
, & (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PubMed]
, , , , , , et al. (2001). Successful aging in the oldest old: who can be characterized as successfully aged?.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1(22), 2694-2700. [PubMed]
, , , , , , , et al. (2014). The influence of subjective aging on health and longevi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Psychology and Aging, 29(4), 793-802.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6-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3-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3-16

- 8083Download
- 4860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