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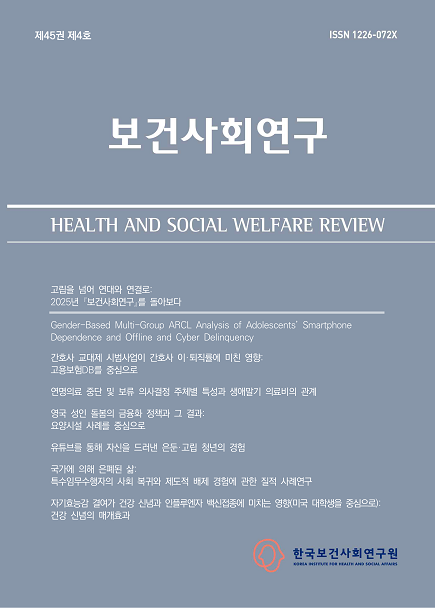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
Attitudes Toward ‘Filial Duty Contracts’ and ‘Anti-Unfilial Piety Bill’ Between Parents and Young Adult Children
Yoo, Gye Sook; Kim, Je Hee*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216-252,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216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itudes toward ‘Filial Duty Contracts’ and ‘Anti-Unfilial Piety Bill’ among 210 college student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nd 198 parents of college student children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We also compared the needs for ‘Filial Duty Contracts’ and ‘Anti-Unfilial Piety Bill’ between two-generation group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ve factors of required filial duty contract details were ‘physical support’, ‘emotional support’, ‘caregiving for sick parents’, ‘economic support’, and ‘normative duty’. Second, for the parent group, ‘emotional support’ was most required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filial duty contract details, followed by ‘caregiving for sick parents’, ‘normative duty’, ‘physical support’, and ‘economic support’ in order. For the college student group, ‘caregiving for sick parents’ was most preferred filial duty contract details, followed by ‘economic support’, ‘emotional support’, ‘normative duty’, and ‘physical support’ in order. Both groups reported that ‘emotional support’ was a high requirement for filial duty contract details. Meanwhile, there were also differences between two-generation groups. The parent group more required ‘normative duty’ contract details than child group, while the child group more preferred ‘economic support’ and ‘caregiving for sick parents’ contract details than their counterpart. Finally, the parent group reported higher levels of needs for ‘Anti-Unfilial Piety Bill’ than the college student child group.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bove are discussed for future study and legislation.
초록
본 연구는 효도계약 조건의 구성요소와 부모・자녀 세대 간 효도계약 조건 및 불효자 방지법안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0명의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198명, 총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효도계약 조건 관련 사항은 ‘신체・물리적 도움’, ‘정서적 지지’, ‘부모 간병’, ‘경제적 부양’, ‘규범적 의무’로 총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 조건에 대해, 자녀 세대는 ‘부모 간병’ 조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특히 ‘정서적 지지’ 조건은 두 세대 공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규범적 의무’ 조건에 있어서 자녀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자녀 세대의 경우 ‘경제적 부양’과 ‘부모 간병’ 조건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셋째, 불효자 방지법안과 관련해서는 부모 세대의 요구도가 자녀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두 세대의 시각차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효도계약에 대해 무려 77.3%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해서도 67.6%가 입법화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석, 2015). 효도계약은 본래 민법에 존재하던 증여계약의 일종인 부담부증여로, 이는 증여계약 시 증여받는 자가 어떠한 의무 및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담 의무에 대한 증여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수정, 2015). 작년 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효도계약을 토대로 재산을 증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서인 효도계약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천금주, 2015). 해당 사건으로 인해 효도계약과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실제 부모 부양을 강제하는 법이 제도화된 상태이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민족 주체성 강화를 위한 국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부모 부양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 부양법이 처음 거론된 당시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 졌다. 언급된 반대 의견들에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 부양을 도덕적 의무로 보는 가족관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된 상태에서 부모 부양을 새삼스럽게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 감정의 문제인 부모 효행을 법제화하기 어렵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송 제기는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를 대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모 부양법을 발의한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인 노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부모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부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던 당시 싱가포르의 사회적 상황상 부모 부양법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었다(이충은, 2015). 또한 유교문화의 발상지인 중국도 효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화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붕괴된 전통적 가족제도로 부모와 자녀 간 부양 문제의 증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 부모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이 관련 법의 부재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 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신동윤, 2015).
이상의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부모에 대한 효와 부양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소송 건수의 증가 외에도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고독사의 점진적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노부모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노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만혼화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이 대졸자 청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노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 자녀들이 오히려 노부모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여부에 관해 살펴 본 이승신(2013)의 연구에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41.5%)보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58.5%)가 더 많았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중년층 부모 세대와 대학생 자녀 세대 간 발생될 문제와 갈등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갈등에 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효도계약은 그러한 사전 조정책의 하나로 향후 그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효도계약 시 어떤 것들이 계약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대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을 거론한 김용길(2016)의 연구가 있긴 하지만 해당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 간 불화를 효 문화와 중재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적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기존의 효・부양의식 관련 연구들(김민희, 홍주연, 2010; 김정란, 김경신, 2009; 정동하, 2009;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승아 등, 2009)을 통해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세대 간 태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들 또한 청소년, 대학생 대상의 자녀 세대(김애희, 박인전, 2007; 김정란, 김경신, 2009; 배문조, 박세정, 2013; 정동하, 2009;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승아 등, 2009) 또는 이들의 중년층 부모 세대(김영미, 한상훈, 2014; 박영신 등, 2016; 전혜성, 김미영, 2012; 정경희, 2012) 등 단일세대로만 접근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중년층은 ‘낀 세대’로서, 가족관계 안에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동시에 갖는 가족 부양자(정성호, 2012; 서수균 등, 2015에서 재인용)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년층이 지닌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김영미, 한상훈, 2014; 박영신 등, 2016; 전혜성, 김미영, 2012)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년기는 또한 ‘예비 노년 단계’(서수균 등, 2015)에 해당하므로, 자녀에 대한 이들의 부양 기대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정경희, 2012)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 대학생 자녀 세대와 그들의 중년층 부모 세대 간 태도를 비교한 연구(김종남, 2014; 정순둘 등, 2012)는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효 의무 규범의 지속 혹은 쇠퇴 여부에 관한 연구 (Tsai et al., 2008; Wang et al., 2009), 효 의무(Aboderin, 2005) 및 세대 간 계약 (Bengtson & Achenbaum, 1993; Croll, 2006)과 관련하여 그 변화를 고찰한 연구, 실제 노부모 부양을 법제화한 중국에 대한 연구(Chou, 2010; Chou, 2011)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상의 국외 연구들 역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양측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단일 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다수가 문헌연구 위주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양측을 모두 포함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와 자녀 두 세대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효도계약이 일반화되고, 불효자 방지법안이 입법화되었을 때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 중 우선적으로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효도계약은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부양 유형과 그 정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일상생활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도움 행위인 부양의식(Uhlenberg, 1996)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개별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 형성과 사회화 과정의 근간이 되므로, 부양의식이라는 개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가족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정란, 김경신, 2009). 특히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한정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법적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이 실제 적용되는 가족 맥락 하에서 해당 조건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노부모를 돌볼 주부양자가 될 대학생들과 이들의 중년층 부모를 대상으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효도계약 조건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두 세대의 요구도 차이와 두 세대 간 차이를 보인 해당 조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건에 대한 부모 자녀 간 인식의 차이는 상호 역할 기대와 적응의 불균형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화는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혜영, 2001). 따라서 효도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효도계약 조건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고, 부모 자녀 간 효도계약 조건의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바라는 효도계약 기준의 절충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세대 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 없는 효도계약 조건의 작성 과정에 커다란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의 개념
세대 간 혹은 연령 집단 간 계약은 세대 및 연령 집단 간 기대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Bengtson & Achenbaum, 1993). 다수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가족 기반의 세대 간 계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는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 받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해왔다(Treas & Wang, 1993; Chou,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의 근대적 변화에 따라 암묵적이었던 세대 간 계약은 부모 세대와 성인 자녀 세대에 의해 다시금 협상되고 재해석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은 더 이상 부모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규범적 측면보다는 필요에 근거한 지원・서비스 및 돌봄에 대한 상호 지원과 더 큰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비롯하여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부모 세대에게 자녀 부양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 세대는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또는 소유 재산 양도라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Croll, 2006).
우리나라에서 효도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효도계약 역시 이전까지 당연시되었던 효의 가치를 증여 재산과 부양이라는 명확한 비용과 보상으로 환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은 본래 민법에 존재하던 증여계약의 일종인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증여계약 시 증여받는 자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담 의무에 대한 증여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수정, 2015). 증여받는 자의 부담 의무는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증여에서는 그것이 효도가 되기 때문에 효도계약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효도계약서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증여 내용과 자녀의 효도 의무 내용을 담아 작성한 각서를 의미한다(방효석, 2016). 즉 효도계약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합의하에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효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의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효도계약서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효도계약이 불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라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법안은 사후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다(김용길, 2016). 즉 불효자 방지법안이란 불효자 방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포괄하는 법률안으로 노부모를 학대하거나 재산 증여 이후 돌변하는 불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불효자 방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민법 제556조에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혹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증여 해제가 소멸함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2016). 그런데 이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계약의 해제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부모들은 증여 이후 자식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당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수 없다. 특히나 앞서 살펴본 효도계약서와 같이 문서화된 서류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과거부터 효를 자식된 도리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녀 간 효를 계약하고, 그것을 문서화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 따라서 불효자 방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패륜적 행위가 있을 시 부모의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민법 제558조 삭제와 증여 해제의 기존 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더불어 증여 해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민병두 의원실, 2015). 이와 함께 현재 친족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규정된 친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 청구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형법 제260조 3항에 따라(법제처, 2016), 피해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다. 즉 친족 폭행 사건은 처벌을 원하거나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좌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신동운, 2014). 이로 인해 친족 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합의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내용을 삭제하여 친족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 불효자 방지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민병두 의원실, 2015).
불효자 방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는 돌려받기 어렵다(방효석, 2016). 따라서 가사소송 전문가들은 효도계약 체결 시 ‘부양의무를 위반했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각서인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길 권고하고 있다. 현재 효도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각서 정도의 요건만 갖추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효도계약 작성 시 부모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목록과 금액을 상세히 적고 자녀에게 바라는 부양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정현수, 최승욱, 2015). 그러나 효도계약의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어서 일반인이 효도계약의 작성에서 실효성이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효도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양의 정도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진 부양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이가옥, 1990), 주로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정서적 지원, 필요로 하는 자원 제공, 인간관계 형성, 이동 시 도움과 같은 일상생활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도움 행위인 부양의식(Uhlenberg, 1996)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서비 스적 부양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김민희, 홍주연, 2010; 김애희, 박인전, 2007; 김윤정, 장세철, 2008; 김정란, 김경신, 2009;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승아 등, 2009). 경제적 부양이란 필요한 생활비 및 용돈 등 금전적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정서적 부양은 감정과 정서를 보듬어주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서비스적 부양이란 병간호와 잔심부름, 청소, 이동 시 도움 등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은주, 김태현, 1994).
한편 근대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도 혈연의 정이 강조되고 가족가치가 사회윤리보다 우선시되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김혜영, 2001),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민희, 홍주연, 2010). 이는 일체의 가치가 가족의 유지・지속과 관련되며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와 더불어 가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별성원보다는 가족의 발전과 안위를 더욱 중시하는 신념과 태도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혜영, 2001).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우선성’, ‘부계 가문 영속화’, ‘부모 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개념을 바탕으로 효도계약 조건을 구성하였다. 부양의식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서비스적 부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여 경제적・물리적 지원’, ‘명절에 부모 꼭 찾아뵙기’, ‘가계 계승을 위한 결혼과 출산 이행’, ‘조부모의 제사 및 묘소 관리’, ‘형제・친척 간 우애 있게 지내기’를 조건으로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효도계약에 대한 태도란 ‘부모의 재산 증여에 상응하여 경제적・정서적 부양 등의 효도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가’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 효도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효도계약서에 어떠한 조 건들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어 문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효 의무를 지는데 이것이 지닌 특별한 의무가 무엇인지, 자녀들의 일반적인 효 의무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Schinkel, 2012). 이때 효도계약서의 조건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의 양, 강도 또는 유형 결정 시 도움을 주어(Finch & Mason, 1990; Aboderin, 2005에서 재인용), 효 의무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효도계약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약속을 이행치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내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김수영, 2013).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해제를 금하는 민법 제558조가 걸림돌이 되어 부모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법원에서 부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지만 자녀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요즘과 동일하게 자녀에 대한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문서화할 것을 권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효자 방지 법안과 유사한 민법상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은윤수, 2013), 통과 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5년 노인학대 및 부양료 청구소송 증가를 근거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세대 간 갈등 예방차원에서 불효자 방지법안의 법제화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다 올해 2016년 9월, 불효자 방지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당 의원의 판단하에 다시금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과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소송 건수는 불효자 방지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보건복지부(2016)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1905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12.6%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노인학대 건수의 증가보다 논란이 된 부분은 노인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이 8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 아들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배우자 15.4%, 딸 10.7% 순으로 학대행위자의 69.6%가 가족으로 밝혀졌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인학대는 절반 이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삶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 자식 간 부양료 청구소송 건수의 증가이다. 대법원의 통계연감(2016)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건수는 2002년도 98건에서 2008년도 195건, 2014년도 262건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중, 도움, 보살핌 제공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효가 침식되고 있는(Croll, 2006)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부모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대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연금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4년 기준 약 49%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14)에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이 중 12.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건강 문제가 24.4%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살과 더불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고독사 문제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고독사 현황을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체해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해 지자체가 장례를 치러준 사망자를 뜻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2011년도 682명에서 2015년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29.6%), 60대(22.7%), 7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남보라, 2016).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독사는 무연고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선기, 2016). 높은 노인자살률과 고독사의 점진적 증가는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존할 가족 혹은 친구의 유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중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수준이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난 조사 결과(국회입법조사처, 2016)와 무관하지 않다. 노인과 관련한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은 노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는 이미 효도계약 및 불효자 방지법안과 유사한 법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신동윤, 2015; 이충은, 2015; Chou, 2010).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995년 부모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도록 법제화하였다(이충은, 2015). 이는 부양 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양의 책무를 저버린 자녀들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Chou, 2010). 다만, 자녀에 대한 노부모 부양 명령은 신청자인 부모의 상황만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대한 이행 정도도 고려되어 최종적인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녀에 한하여 부양 의무가 부담되고 있다(이충은, 2015). 중국의 경우에는 1996년 노부모 세대의 정서적 빈곤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노인권익보장법’(中国人民共和国民政部, 1996)이 제정되 었다. 그러다 2013년도에는 기존 내용에 ‘부모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길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와 법적 제제가 강조되었다. 특히 해당 법은 부모 자녀 관계의 완전한 단절 혹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자녀의 폐륜적 행동에 대해 부모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신동윤, 2015).
이러한 법 제도와 함께 중국에서는 부모 부양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 지역사회를 통해 가족 지원 협약(FSA: Family Support Agreement)이 출현하였다. 가족 지원 협약 (FAS)이란 생활수준과 부모의 건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성인 자녀가 부양의 유형과 실제적인 양은 자발적으로 협상하되 협상 내용에 대한 위반은 법으로 처벌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협약은 정부에 의해 홍보 및 모니터링이 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협약 내용이 갱신되고 있다(Chou, 2010). 또한 가족 지원 협약(FAS)의 필요성 평가와 채택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시민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Chou, 2011). 중국 지방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노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 지원 협약(FAS)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노년기 부양을 보장받기 위해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족 지원 협약(FSA)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20명 중 1명 이상은 실제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지원 협약(FAS)에 대한 서명은 해당 협약의 필요성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hou, 2011).
우리보다 앞서 부모 부양과 관련한 사항을 법제화한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의 가족 지원 협약(FAS)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해당 협약은 개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 유형과 빈도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 자율적으로 협상하되, 계약 내용의 실행 여부에 있어서만 법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개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부양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법제화할 경우 단지 몇 가지 법적 기준을 만들어 모든 가족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가족이 처한 상황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가족 지원 협약(FAS)의 적용과 유지, 점검에 있어서 정부・지역 사회・시민단체들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여타 제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 대상의 제도인 경우에는 특히 개별 가족에 대한 접근성과 제도의 활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역 사회 및 시민단체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할 수 있다.
작년 말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실제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김영석, 2015).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 40대, 20대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불효자 방지법안의 경우에는 입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7.7%로, 입법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3배 많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 40대, 30대 순으로 입법화 찬성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에는 찬성 40.2%, 반대 44.6%로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20대 자녀 세대와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간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약에 대한 필요성 평가와 협약 체결이 서로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Chou, 2011)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효도계약의 체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불효자 방지법안이 입법화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제도와 법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가족 맥락 하에서 해당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세대별 태도
현재까지 성인 자녀의 효도와 노부모 부양에 관하여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근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실증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부모 부양을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여기는 데 일조한 것에 의하면(김정란, 김경신, 2009), 가치관과 부양 관련 인식은 서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의 발생 배경도 근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양을 자녀의 도리가 아닌 하나의 교환으로 보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부양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세대 간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효도계약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상호 간 합의가 바탕이 되므로, 청소년과 대학생인 자녀 세대의 태도와 더불어 이들의 부모 세대가 되는 중년층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효・부양 관련 선행연구는 단일 세대 대상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 대학생 자녀 세대와 그들의 중년층 부모 세대 간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김종남, 2014; 정순둘 등, 2012)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인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향후 주부양자가 될 이들의 효의식과 부양의식을 살펴본 연구(김민희, 홍주연, 2010; 김정란, 김경신, 2009; 정동하, 2009;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승아 등, 20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김영미, 한상훈, 2014; 박영신 등, 2016; 전혜성, 김미영, 2012)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노년기로 넘어가는 ‘예비 노년 단계’(서수균 등, 2015)로서의 중년기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특히 자녀에 대한 이들의 부양 기대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정경희, 2012)는 소수에 불과하다.
효도계약의 구성 조건 중 하나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효・부양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부양의식을 정서적, 신체적・서비스적, 경제적 부양의식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자녀 세대의 경우 정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김민희, 홍주연, 2010; 김애희, 박인전, 2007), 신체적・서비스적 부양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최승아 등, 2009),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김윤정, 장세철, 2008; 김정란, 김경신, 2009)가 공존하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부양의식을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 인식에 관한 변인을 살펴본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서 중년층 부모 세대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좋은 노부모 부양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결과를 통해 중년층 부모 세대의 경우 자녀 세대로부터 정서적인 측면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베이비붐 부모 세대와 에코붐 자녀 세대 250쌍을 대상으로 부양 기대와 부양의식을 조사한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부모 세대의 부양 기대는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에코붐 자녀 세대의 부양의식은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순으로 높게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 두 세대 간에 부양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효도계약 조건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모와 자녀 두 세대의 보다 더 뚜렷한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비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김경신, 2009; 김혜영, 2001; 배문조, 박세정, 2013). 반면, 중년층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들(김영미, 한상훈, 2014; 최인영, 최혜경, 2009)에서는 근대화를 거친 중년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현대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연구(정옥분 등, 2007; 최정혜, 1999)에서는 세대가 낮아질수록 비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였다.
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과는 달리 효도와 부모 부양에 대한 이유, 부모 부양 실천의 장애요인 및 불효의 개념에 대해서 세대 간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선, 부모 부양에 대한 이유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효도와 부양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 연구들(김혜영, 2001; 류은주, 2012; 박영신 등, 2014)에서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등, 2011)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효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등, 2013)에서도 부양의 주요한 이유로 부모와 자녀 두 세대 모두 ‘부모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동일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부양 실천의 장애요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등, 2016)에서 노부모 부양 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으로 ‘의견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등, 2013)에서도 두 세대 모두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효의 개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 대한 연구(박영신 등, 2009; 박영신 등, 2009; 박영신 등, 2011)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인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등, 2014) 결과, 부모와 자녀 세대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불효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효・부양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효와 부양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Wang과 그의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효가 문화의 근본적인 교리가 되어 가족이 노부모 부양의 원천이 되어온 중국의 경우 사회 변화에 따라 성인 자녀에 대한 노부모 세대의 효 기대수준의 평균이 감소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효에 대한 믿음은 부모 세대에 의해 중요한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해당 연구 결과에서 자녀의 효에 대한 기대와 기대하지 않음이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효에 대한 기대감과 기대하지 않음이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효 기대에 대한 생각에 기대하지 않음이 하나의 구성요소가 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는 낮은 수준의 기대하지 않음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하지 않음과 관련된다. 이러한 효에 대한 기대하지 않음의 개념 출현을 효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현대의 재개념화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노부모 세대에게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부양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 등,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한국의 부모 세대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효와 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자녀 세대인 대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Tsai와 그의 동료들(2008)의 연구 결과, 현대의 자녀 세대는 효의 실천에 있어서 자기희생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부모 부양과 자녀 본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세대 간 행복 달성으로의 관점 변화를 보여 주었다.
다른 유교문화권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재산과 부양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계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아시아 사회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사회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가족의 의무와 조화에 높은 가치가 부과되었으며,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에 대한 보은의 개념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중과 보살핌 제공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다른 모든 의무 이전에 나이 든 세대에 대한 존중과 지지가 강조되어 성인 자녀 본인 및 본인의 자녀 돌봄보다 부모 돌봄이 더욱 강조되었다. 즉 과거 아시아 사회의 세대 간 계약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부모와 조부모의 안녕을 위한 젊은 세대의 복종 및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로 인해 노부모 세대와 성인 자녀는 세대 간 계약 방식을 재교섭하고 재해석하게 되었다. 즉 현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양을 보은의 차원보다는 실질적인 부양 및 돌봄에 대한 상호 필요의 양방향의 교환수 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성인 자녀 본인 및 본인의 자녀 돌봄이 부모 돌봄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효 의무라는 것도 성인 자녀 본인 혹은 성인 자녀가 형성한 직계가족의 현재의 생활수준이나 미래의 복지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성인 자녀의 능력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oderin, 2005). 이와 더불어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향후 장기간 안전 및 돌봄을 보장받는 대가로 토지, 주택 또는 기타 자산의 양도 등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교섭에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이 있다. 첫 번째는 해당 협상 과정 또는 전략에 부여된 목적 또는 의식의 정도이며,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두 세대 모두에 의해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정도이다. 즉 현대 아시아 사회의 세대 간 계약은 과거와 같이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가는 일방 향성에서 쌍방향성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중년층 부모 세대와 청소년 자녀 세대는 효・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효・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기초로 구성된 효도계약 조건에 대해서 세대 간 태도 차이의 발생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효도와 부모 부양에 대한 이유, 부모 부양 실천의 장애요인 및 불효의 개념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서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도와 부모 부양의 이유, 불효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인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해서 세대 간 대체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윤리적・규범적 측면의 효와 부양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효・부양에 대해서 쌍방의 교환적인 계약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자녀 간 효도와 부양은 유지되고 있지만 인식과 실천적인 면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효도 계약 조건에 대한 양측의 태도를 현시점에서 실제적으로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7~8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유목적적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217명,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216명, 총 43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20명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이 중 조사 시점 현재 부모 모두가 생존해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자료와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08명의 자료(자녀 세대 210명, 부모 세대 198명)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시점 현재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지 않은 대학생을 응답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대학생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특징
| (N=408) | |||||
|---|---|---|---|---|---|
| 연령집단 구분 | 변인 | 구분 | 빈도(%) | M(SD) | 범위 |
| 부모세대 (n=198) | 성별 | 남 | 100(50.5) | ||
| 녀 | 98(49.5) | ||||
| 만 연령(세) | 52.43(5.11) | 42-71 | |||
| 결혼 상태 | 기혼 | 190(96.0) | |||
| 이혼 | 6(3.0) | ||||
| 사별 | 2(1.0) | ||||
| 자녀 수(명) | 1.99(66.29) |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80(40.4) | |||
| 대졸 | 93(47.0) | ||||
| 대학원 졸 | 25(12.6) | ||||
| 직업 | 전문직 | 14(7.1) | |||
| 관리직 | 24(12.1) | ||||
| 사무기술직 | 52(26.3) | ||||
| 판매서비스직 | 27(13.6) | ||||
| 자영업 | 23(11.6) | ||||
| 농림어업 | 5(2.5) | ||||
| 단순노무직 | 2(1.0) | ||||
| 무직, 전업주부 | 51(25.8) | ||||
| 거주형태 | 자가 | 168(84.8) | |||
| 전세 | 23(11.6) | ||||
| 월세 | 4(2.0) | ||||
| 기타 | 3(1.5) | ||||
| 주관적 경제수준 | 상 | 17(8.6) | |||
| 중 | 167(84.3) | ||||
| 하 | 14(7.0) | ||||
| 총자산(만원) | 94,025 (412,033.11) | 1,000-5,500,000 | |||
| 월평균 소득(만원) | 691 (1,820.88) | 100-25,000 | |||
| 자녀세대 (n=210) | 성별 | 남 | 82(39.0) | ||
| 녀 | 128(61.0) | ||||
| 만 연령(세) | 22.08(2.59) | 18-29 | |||
| 출생순위 | 첫째 | 93(44.3) | |||
| 둘째 이하 | 99(47.1) | ||||
| 외동 | 18(8.6) | ||||
| 응답자를 포함한 형제 수(명) | 2.12(67.15) | ||||
| 부모의 거주 형태 | 자가 | 150(71.4) | |||
| 전세 | 39(18.6) | ||||
| 월세 | 14(6.7) | ||||
| 기타 | 6(2.9) | ||||
| 주관적 경제수준 | 상 | 34(15.7) | |||
| 중 | 160(76.1) | ||||
| 하 | 15(7.2) | ||||
| 부모의 총자산 (만원) | 44,360 (47,072.69) | -2,000-35,000 | |||
| 원가족 월평균 소득(만원) | 580 (513.31) | 100-5,000 | |||
2. 측정도구
대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효도계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효・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윤경, 2002; 서소영, 1998; 안혜숙, 2005; 저윤평, 2014;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연희, 2008)를 토대로 총 22문항의 4점 척도를 부모 세대용과 자녀 세대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 효도계약을 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조건(예: 자녀는 부모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비 및 용돈 등을 지원하도록 함)에 대하여 응답자가 ‘전혀 불필요’ 1점, ‘대체로 불필요’ 2점, ‘대체로 필요’ 3점, ‘반드시 필요’ 4점으로 평정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도계약 시 해당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전체 모두 .92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나타난 2차 자료들, 주로 기사(매일경제, 2015; 은정진, 2015; 최정식, 2015) 를 토대로 총 7문항의 4점 척도를 역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척도는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한 목적(예: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함)에 대하여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목적으로 인해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 세대 .90, 자녀 세대 .83, 전체 .87로 양호하였다. 이외에 응답자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족의 월평균 소득,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 학적 특징을 질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부모와 자녀 간 효도계약 조건의 구성 요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408명이 실제 효도계약을 할 경우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22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하위 요인은 전체 변량의 7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물리적 도움’(예: 잔심부름하기, 집안일 돕기, 부모의 지인 방문 시 대접에 신경 쓰기), ‘정서적 지지’(예: 방문 및 안부전화하기, 기념일에 함께 식사하기, 자주 대화하기), ‘부모 간병’(예: 부모가 편찮을 시 병간호 잘하기, 부모의 거동이 불편할 시 이동에 도움 드리기), ‘경제적 부양’(예: 부모에게 병원비・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하기), ‘규범적 의무’(예: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여 경제적・물리적 지원하기, 명절에 꼭 찾아뵙기, 조부모의 제사 및 묘소 관리하기)로 명명하였다. 이상 다섯 가지 요인들의 신뢰도는 .76에서 .85까지였으며, 각 요인의 적재치 범위 또한 .54 부터 .85까지로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매우 양호하였다.
표 2
효도계약조건 주성분분석 결과
| (N=408) | ||||||||
|---|---|---|---|---|---|---|---|---|
|
|
||||||||
| 문항 | 효도계약 조건 | Cronbach's α | ||||||
|
|
|
|||||||
| 신체ㆍ 물리적 도움 관련 | 정서적 지지 관련 | 부모 간병 관련 | 경제적 부양 관련 | 규범적 의무 관련 | 전체 (N=408) | 부모 (n=198) | 자녀 (n=210) | |
|
|
||||||||
| 부모가 원할 때 잔심부름하기 | .72 | .23 | .31 | .10 | .16 | .85 | .82 | .87 |
| 부모가 원할 때 집안일 돕기 | .68 | .19 | .43 | .10 | .12 | |||
| 부모의 의복 청결에 신경 쓰기 | .59 | .17 | .31 | .22 | .25 | |||
| 부모의 잔소리를 이해 | .56 | .42 | .03 | .07 | .16 | |||
| 좋은 대화 상대 및 부모의 지인 방문 시 대접에 신경 쓰기 | .56 | .39 | .22 | .10 | .25 | |||
| 부모의 선호 음식 고려, 쇼핑목록에 참견 않기 | .55 | .30 | -.07 | .09 | .33 | |||
| 방문 및 안부 전화 | .16 | .73 | .17 | .27 | .07 | .81 | .75 | .84 |
| 가족여행 및 기념일에 함께 식사 | .29 | .71 | .06 | .04 | .21 | |||
| 부모와 자주 대화 | .23 | .71 | .31 | .07 | .07 | |||
| 집안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 | .31 | .61 | .12 | .06 | .11 | |||
| 부모가 편찮으실 때 병간호 잘하기 | .12 | .22 | .74 | .27 | .08 | .79 | .76 | .80 |
| 부모가 병석에 눕게 되면 병수발을 잘해드리기 (목욕, 세수, 대소변 등) | .24 | .15 | .71 | .28 | .03 | |||
| 부모의 사무처리 능력 저하 시 성년후견인 행사 | .10 | .11 | .66 | .02 | .28 | |||
| 부모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이동에 도움 드리기 | .46 | .21 | .58 | .16 | .21 | |||
| 병원비, 건강검진비용 지원 | -.02 | .11 | .22 | .85 | .07 | .84 | .87 | .70 |
| 생활비, 용돈 등을 지원 | .07 | .10 | .20 | .85 | .03 | |||
| 취미생활, 여행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 .27 | .08 | .05 | .78 | .03 | |||
|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여 경제적・물리적 지원 | .26 | .20 | .22 | .16 | .70 | .76 | .78 | .76 |
| 명절에 부모 꼭 찾아뵙기 | .08 | .50 | .25 | .04 | .64 | |||
| 가계계승을 위해 결혼과 출산 이행 | .40 | .17 | -.03 | -.18 | .61 | |||
| 조부모의 제사 및 묘소 관리 | .25 | -.13 | .16 | .30 | .60 | |||
| 형제・친척 간 우애 있게 지내기 | .06 | .46 | .30 | -.19 | .54 | |||
2. 효도계약의 조건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요구도 비교
효도계약조건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요구도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이들의 개별적 요구도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개별적인 효도계약 조건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2.56≦M≦3.29)의 요구도를 보였다. 각 세대의 조건별 요구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 조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이어서 ‘부모 간병’, ‘규범적 의무’, ‘신체・ 물리적 도움’, ‘경제적 부양’ 조건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반면,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 간병’ 조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규범적 의무’, ‘신체・물리적 도움’ 조건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표 3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효도계약 조건에 대한 요구도 차이
| (N=408) | |||
|---|---|---|---|
| 요인 | M(SD) | t | |
| 부모 (n=198) | 자녀 (n=210) | ||
| Ⅰ. 신체ㆍ물리적 도움 관련 조건 | 2.75(.49) | 2.72(.61) | .53 |
| Ⅱ. 정서적 지지 관련 조건 | 3.14(.50) | 3.08(.64) | 1.00 |
| Ⅲ. 부모 간병 관련 조건 | 3.06(.51) | 3.29(.53) | -4.52*** |
| Ⅳ. 경제적 부양 관련 조건 | 2.56(.76) | 3.16(.50) | -9.33*** |
| Ⅴ. 규범적 의무 관련 조건 | 2.99(.55) | 2.77(.60) | 3.77*** |
| 효도계약에 대한 요구도(전체) | 2.91(.43) | 2.96(.47) | -1.26 |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효도계약의 조건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물리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 조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 조건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공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세대의 경우 ‘경제적 부양’(t = -9.33, p < .001)과 ‘부모 간병’(t = -4.52, p < .001) 조건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규범적 의무’(t = 3.77, p < .001) 조건에서 자녀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이며 세대 간 요구도 차이를 나타냈다.
3.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요구도 비교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요구도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이들의 개별적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효자 방지 법안에 대해서 부모 세대(M=2.83)와 자녀 세대(M=2.63) 모두 대체로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였다. 각 세대의 목적별 요구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재산 증여 후 거리로 내몰리는 노인들로 인한 막대한 노인복지 비용의 발생’을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한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냈다. 이어서 다음의 목적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 행으로부터의 노부모 구제’, ‘불효자 방지법안으로 인한 가족 간 도덕적 가치 왜곡・경직’,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기존 민법의 폭넓은 증여 취소 사유 인정 가능’, ‘어떤 경우에 불효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민법상의 한계’, ‘증여는 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증여하지 않으면 됨’의 순으로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함을 보였다. 한편 자녀 세대들은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행으로부터의 노부모 구제’를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한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냈다. 이어서 다음의 목적 ‘재산 증여 후 거리로 내몰리는 노인들로 인한 막대한 노인복지 비용의 발생’, ‘불효자 방지법안으로 인한 가족 간 도덕적 가치 왜곡・경직’, ‘기존 민법의 폭넓은 증여 취소 사유의 인정 가능’,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증여는 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증여하지 않으면 됨’, ‘어떤 경우에 불효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민법상의 한계’ 순으로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표 4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요구도 차이
| (N=408) | ||||
|---|---|---|---|---|
| 변인 | M(SD) | t | ||
| 부모 (n=198) | 자녀 (n=210) | |||
| 불효자 방지법안이 실행된다면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하다. | 2.97(.85) | 2.98(.80) | -.08 | |
|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거리로 내몰리면 향후 사회적으로 엄청난 노인복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 3.13(.79) | 2.94(.75) | 2.46* | |
|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 | 2.75(.94) | 2.51(.88) | 2.69** | |
| 불효자 방지법안으로 인해 가족 간의 도덕적 가치가 왜곡・경직될 것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하다.* | 2.83(.87) | 2.66(.82) | 1.99* | |
| 부모의 증여는 자유의사에 따르고,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증여하지 않으면 되므로 불필요하다.* | 2.66(.87) | 2.43(.78) | 2.78** | |
| 기존 민법의 증여 취소 사유(부양 유기, 범죄 등)를 현행 규정보다 폭넓게 인정하면 되므로 불필요하다.* | 2.74(.86) | 2.55(.66) | 2.49* | |
| 민법 특성상 어떤 경우에 불효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 2.71(.89) | 2.33(.77) | 4.59*** | |
|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요구도(전체) | 2.83(.69) | 2.63(.55) | 3.21** | |
다음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불효자 방지법안의 요구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행으로부터의 노부모 구제’ 이외의 대다수의 목적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 불효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민법상의 한계’(t = 4.59, p < .001)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 차이를 보였으며, ‘증여는 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증여하지 않으면 됨’(t = 2.78, p < .01),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t = 2.69, p < .01), ‘기존 민법의 폭넓은 증여 취소 사유 인정 가능’(t = 2.49, p < .05), ‘재산 증여 후 거리로 내몰리는 노인들로 인한 막대한 노인복지 비용의 발생’(t = 2.46, p < .05), ‘불효자 방지법안으로 인한 가족 간 도덕적 가치 왜곡・경직’(t = 1.99, p < .05)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효도계약, 불효자 방지법안과 관련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층 부모 세대와 대학생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효도계약 조건의 구성요소와 부모 자녀 간 효도계약 조건 및 불효자 방지법안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과 대학생을 둔 부모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실질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 부모 세대와 대학생 자녀 세대가 인식하는 부모 자녀 간 효도계약의 조건은 ‘신체・물리적 도움’, ‘정서적 지지’, ‘부모 간병’, ‘경제적 부양’, ‘규범적 의무’의 총 다섯 가지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김민희, 홍주연, 2010; 김애희, 박인전, 2007; 김윤정, 장세철, 2008; 김정란, 김경신, 2009; 조윤주, 이숙현, 2004; 최승아 등, 2009)이 주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서비스 적 부양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과 연관되는 ‘규범적 의무’ 조건의 포함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김민희, 홍주연, 2010)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양 의식 관련 연구들이 간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부양의식 선행연구들의 신체적・서비스적 부양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병’과 ‘신체・물리적 도움’ 조건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부양과 효의 실천이 결코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Traphangan, 2006; Tsai et al., 2008에서 재인용), 효・부양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부모 부양과 효도 관련 연구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요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 조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이어서 ‘부모 간병’, ‘규범적 의무’, ‘신체・물리적 도움’, ‘경제적 부양’의 조건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 간병’ 조건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지지’, ‘규범적 의무’, ‘신체・물리적 도움’ 조건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세대 간 요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물리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 조건에서는 부모 자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당 조건들에 대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규범적 당위성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세대 간 요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특징은 두 세대 모두 ‘정서적 지지’ 조건에 대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 자녀 간 효도계약 시 ‘정서적 지지’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양 관련 선행연구들(김윤정, 최유호, 2007; 이호정, 2008; 조윤주, 이숙현, 2004) 에 따르면,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부양의 중요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윤주와 이숙현(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자녀 간 애착 정도가 정서적 지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계약상의 ‘정서적 지지’ 조건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관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캥거루족의 증가로 인해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가족생애주기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모 자녀 관계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요구도 차이의 두 번째 특징은 자녀 세대의 경우, ‘경제적 부양’과 ‘부모 간병’ 조건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인 반면,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규범적 의무’ 조건에서 자녀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세대의 경우 아직까지 조상숭배와 더불어 친족관계까지 포괄하는 전통적인 효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성인 자녀 세대는 기능적 측면의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김유경 등, 2014)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 관련 연구에서 중년층 부모 세대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인 반면(김영미, 한상훈, 2014; 최인영, 최혜경, 2009), 청소년과 대학생 자녀 세대는 비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였다(김정란, 김경신, 2009; 김혜영, 2001; 배문조, 박세정, 2013). 또한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핀 연구(정옥분 등, 2007; 최정혜, 1999)에서는 세대가 낮아질수록 비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였다. 해당 연구들을 통해 가족주의 가치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규범적 의무’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의 쇠퇴를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족주의 대신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로의 변화는 각 구성원의 평등하고 건강한 삶과 가족의 통합・유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변화순, 1994; 변화순 등, 2001에서 재인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효도계약은 부모와 자녀가 효와 부양에 대한 서로의 요구를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조건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 법적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가족의 통합 유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을 영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이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점진적 증가세에 따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총 27.2%(통계청, 2016)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가족의 종언’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실상 ‘정상가족 내지 전형적 가족의 위기’로(최유정 등, 2011),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율과 상호 의존이라는 상반된 관계의 조정에 따라 내용적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변화순 등, 2001). 다만, 단일한 형태의 가족(family)에서 다양한 가족(families)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가족의 자체적인 기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외부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수선, 2010). 이러한 상황에서 효도계약은 가족 가치에 대한 실행을 격려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요구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실제 효도계약 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조건들에서 요구도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인해 세대 간 가치와 지향이 바뀌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도계약 조건이 안착되기 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이하게 겪은 사회・문화적 경험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정옥분 등, 2007),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 세대는 ‘노인복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자녀 세대는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행으로 부터의 노부모 구제’의 측면에서 불효자 방지법안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특히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행으로부터의 노부모 구제’의 측면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비슷한 수준의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노부모의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노부모를 폭언・폭행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산 증여 후 자녀 폭언・폭행으로부터의 노부모 구제’ 이외에 불효자 방지법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모 세대의 요구도가 자녀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두 세대의 시각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증여자인 부모 세대가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해서 자녀 세대보다 더 실제적인 관심을 지닌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20대 자녀 세대와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난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가장 큰 요구도 차이를 보인 문항은 ‘불효자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의 한계’였다. 연구의 한계로 해당 결과와 관련하여 두 세대가 불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부모 세대가 좀 더 전형적이고 제한적으로 불효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자녀 세대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지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불효로 인식한다고 보았던 선행연구들(박영신 등, 2009; 박영신 등, 2009; 박영신 등, 2011; 박영신 등, 201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효자 방지법안 의 실제적인 입법에 앞서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함께 모여 불효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효자 방지법안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해당 토론회는 현재 노인 부모 세대와 법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향후 법 적용의 대상은 지금의 청년 자녀 세대와 중년층 부모 세대가 될 것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부모 세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 자녀 세대보다 낮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효도와 부모 부양의 이유에 대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한 연구들(김혜영, 2001; 류은주, 2012; 박영신 등, 2011; 박영신 등, 2013; 박영신 등, 2014)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에 대한 가족 장기 돌봄이 명백하게 감소하거나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Aboderin, 2005), 이제는 효도를 규범적으로만 고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대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서는 세대 간 시각차가 전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대 간 격차는 노부모 돌봄에 대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Tsai et al., 2008), 효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생각 및 투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Wang et al., 2009). 즉 인식의 차이는 상호 역할 기대와 적응의 불균형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화는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혜영, 2001) 부모・자녀 세대 간 요구도 차이를 보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세대 간 시각차를 좁혀 향후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세대 간 의사소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Tsai et al., 2008). 따라서 개별적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인식 공유를 통해 효도계약 조건의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대 간 격차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세대갈등 정도가 약 5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국회입법조사처, 2016)와 자녀와의 합의 없이 부모 일방의 의견만으로 금융사를 통해 부모 생전 혹은 사후에 재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성택, 2016) 등은 부모 자녀 간 신뢰감 부재에서 비롯된 상호작용 단절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에릭슨 (Erikson, 1963)의 사회심리이론에 의하면, 자아의 첫 번째 과제를 ‘기본적 신뢰감 및 불신감 형성’이라고 하였다. 기본적 신뢰감 형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돌봄의 질로, 아이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양육자의 양육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끔 한다. 특히 이때 형성된 기본적 신뢰감은 향후 아이가 맺게 될 사회적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애 초기 부모에 의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예비부부 또는 임신 전후 부부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향후 부모 자녀 간 신뢰감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한 연구 대상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표성을 띠는 샘플링을 통해 보다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집단과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부모와 자녀의 태도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실제 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 이들을 쌍으로 표집한다면 좀 더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서적 학대가 법적으로 명시되며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까지 고려한 효도계약 조건 구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구의 중산층 이성 초혼 핵가족만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가족의 발달단계를 가정한 가족발달이론(Bengtson & Allen, 1993; Burr, 1973; Falicov, 1998; 유계숙 등, 2005에서 재인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회의 변화와 함께 형성된 1인 가구, 동거 가구, 캥거루족이 포함된 가구 등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존 가족발달이론의 전제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한 효도계약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가 극히 미흡한 상황에서 효도계약 조건과 불효자 방지법안과 관련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부모 자녀 관계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효도계약의 입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References
. (2013). “넌 말로만 효도하니!”…소송 거는 부모들. http://www.nocutnews.co.kr/news/4313292에서 2016.11.06. 인출.
. (2015). “국민 77.3%, 부모-자식 간 효도계약 필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11171&code=61111111&cp=nv에서 2016.09.05. 인출.
. (2016). 무연고 사망자 5년 새 2배 ‘역대 최대’. http://www.hankookilbo.com/v/37269243e0fb451f85116d4aacc4e012에서2016.11.21. 인출.
. (2016). 2002년, 2008년, 2014년 가사, 행정, 특허, 선거 사법연감(통계).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16.11.21. 인출.
. (2015). [이슈 토론] 불효자 방지법.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098357에서2016.03.22. 인출.
, . (2015).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PAMP1000046080&sysid=nhn에서 2016.12.07. 인출.
. 2016, 민법 제556조, 민법 제558조, 형법 제260조 3항,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AF%BC%EB%B2%95#undefined, 에서 2016.11.30. 인출. .
. (2013). 정수성 의원, ‘효도법’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28380&thread=11r02에서2016.11.06. 인출.
. (2015). ‘불효자 방지법’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149401에서2016.03.22. 인출.
. (2016). 무연고 사망자 수 해마다 증가⋯1인 가구 증가 ‘대책시급’.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5에서2016.11.20. 인출.
. (2016). 치매 이후 대비, 반려동물 미래 ⋯ 별걸 다 해주는 신탁. 시사포커스. http://www.hankookilbo.com/v/ccf6161d72184624b9c50041d5a90c69에서2016.01.15. 인출.
, . (2015). 효도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부양의 정도・증여 재산’ 구체적 명시 필요.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72883&code=11131100&cp=nv에서 2016.11.06. 인출.
. (2015). 대법 “헌신하다 헌신짝 된 부모 재산 돌려받는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cticle/view.asp?arcid=0010199038&code=61121111&cp=nv에서 2016.11.06. 인출.
1996,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 http://www.mca.gov.cn/article/zwgk/fvfg/shflhshsw/200709/20070900001735.shtml, 에서 2017.03.03. 인출. .
(2010). Filial piety by contract? The emergence,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Family Support Agreement” in China. The Gerontologist, 51(1), 3-16. [PubMed]
(2011). Perceived need and actual usage of the family support agreement in rural China: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The Gerontologist, 51(3), 295-309. [PubMed]
, , & (2008). Perceptions of filial piety among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3(3), 284-290. [PubMed]
(1996).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s age. The Gerontologist, 36(6), 761-767.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3-0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3-13

- 5315Download
- 313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