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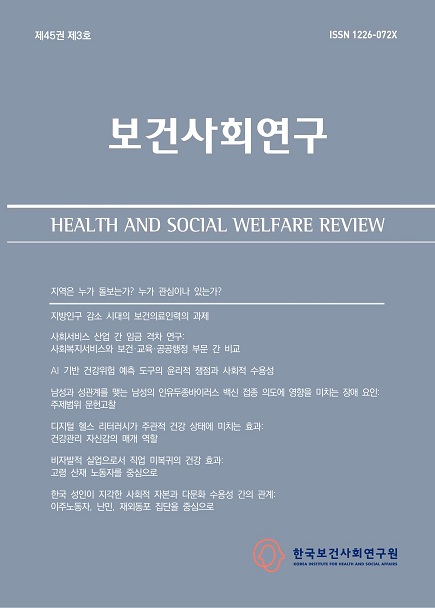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nflicts Among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Lee, Sang-Jo; Cho, Sungsook*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332-366,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33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efficiently manage organizational conflicts of care workers working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further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conflic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ese purposes, we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surveys among the care workers engaged in the 22 elderly care facilities in 10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buk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ith the SPSS WIN v21.0 and the AMOS v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onflict of care worke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Second, although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the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flict and social support.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nflicts among care worker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지역 10개 시・군 소재 22개의 노인요양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21.0과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 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서 조절효과의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유용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Ⅰ. 서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부양문제가 주요 사회이슈로 부상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제도 시행 전인 2006년에는 815개소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33개소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성장과 함께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년 현재 시설노인요양기관의 총 운영인력은 79,103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요양보호사는 60,386명으로 전체 운영인력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이런 의미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가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41%를 상회하는 등 2015년의 산업전체 평균 이직률인 4.6%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1년 한국노인중앙회 정책연구소 자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평균 41.06% 로 나타났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13) 자료에서도 평균 4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직은 잔여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 및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기술 축적을 방해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의 이직관리는 노인요양시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요양보호사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의 이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영역의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주로 조직스트레스(권현숙, 2014; 김행렬, 모지환, 김석호, 2010), 직무만족(김소정, 2012), 조직문화(박길태, 김세영, 2014), 조직 내 갈등(박현주, 2011) 등과 같은 조직 차원의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개인 차원의 요인보다는 그들의 근무환경 등 조직 차원의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조직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특히 조직 내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성옥, 2005; 황규대, 박상진, 이광희, 이철기, 2007; Bedeian & Armenakis, 1981; Schermerhorn, Hunt, & Osborn, 2011).
그러나 이직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조직 내 갈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박현주, 2011; 이영화, 임왕규, 2011). 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호텔 식음료분야, 미용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 내 갈등이 조직 성과(김성실, 최영희, 김미경, 2013), 조직유효성(노재현, 2005), 조직헌신과 직무만족 (백영미, 1994), 직무스트레스(윤은아, 박경일, 2013)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방어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Hobfoll & Vaux, 1993),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고찰하고 있는 연구는 박현주 (2011)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조직 내 갈등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노인의 고독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 잔존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간호사, 가족, 의사에게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요양 보호사 등의 사회적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었으나(정기원, 2010),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다양한 갈등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행열, 모지환, 김석호, 2010).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많았고 임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12)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임금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 월 130-140만원(2-3 교대, 월 5일 휴무), 시간제의 경우 시간당 7천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신체수발이나 가사지원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일로 여겨져 수급자와 그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허용하는 업무 범위보다 더 많은 범위의 일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역할갈등이 발생하여 요양업무의 기피 및 이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정, 2010).
갈등 관련 고전적인 연구자인 Dahrendorf(1959)는 조직 내 다양한 불일치들이 갈등의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고, Rahim(2002)은 이익(interest), 선호(preference), 집행(implementation), 만족(satisfaction), 태도(attitudes), 가치(value), 기술(skills), 목표(goals) 등의 조직 내 불일치 요소들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 관련 문헌은 이처럼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 및 조직구조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일치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Amason, 1996; Baron, 1990; Dahrendorf, 1959; Jehn, 1994; 1995; Preffer, 1981; Rahim, 2002).
갈등은 조직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조직의 갈등 해소가 원활하지 않아 갈등의 역효과가 누적되어 분출될 경우 조직성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순기능적이고 건설적인 갈등은 조직의 생존과 성공에 필요한 혁신적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즉, 순기능적 갈등이 역기능적 갈등이 될 수 있고, 역기능적 갈등이 순기능적 갈등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당연히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제거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갈등에 대한 근대적인 관점에서는 갈등을 조직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obbins, 1990).
이와 같이 갈등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오늘날 조직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생하기 마련인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조직 관리자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자극하면서 조직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갈등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갈등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이직이란 현 근무지에서 업무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근무지나 다른 직무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한 지역의 직업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과 지역 간 이동을 뜻하며(김성민, 2008), 좁은 의미에서는 재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 외부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이성윤, 2002). 또한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나려는 계획적인 생각을 품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Robert & John, 1993), 근로자가 가까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조직을 영구히 떠날 주관적 가능성을 개인 자신이 추정하는 것이다(Vandenberg & Nelson, 1999). 즉, 이직의도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 혹은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 생각, 결심을 의미하며, 이는 이직을 예견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예측요인이다(Price & Mueller, 1981).
최근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은 약 41%로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3), 높은 이직률은 인력관리에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김성희, 2001).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이직 관련 연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조희숙, 2012).
이직의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 소진,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이 이직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소정, 2012; 박길태, 김세영, 2014; 박영숙, 2010; 오영미, 2010; 이준상, 김만호, 2005; 이형렬, 2012; 최광수, 2012). 또한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Gupta와 Beehr(1979)는 갈등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두 변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급호텔 조리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김정수(2007)의 연구에서도 갈등과 이직의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는데, 복지나 복리후생에 대한 갈등이 많을수록 보상적 측면을 위해 이직이 증가하며 동료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호텔 식음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최웅, 김경호, 안동화(2015)의 연구에서는 부서의 조직 갈등요인인 의사 소통갈등과 보상갈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의존갈등, 역할갈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간의 의사소통 및 보상갈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상갈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복지조직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갈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현주(2011)는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개인과 집단 간 갈등 순으로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지영(2008)은 역할갈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역할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권현숙(2014)의 연구에서도 조직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보상부적절, 관계갈등, 그리고 조직문화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개인적 갈등과 개인 간 갈등이 심할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경일, 권진아, 김정근, 2014), 이영화(2011), 이영화와 임왕규(2011)의 연구 또한 요양보호사의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직의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 15개 기관의 노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형렬(2012)의 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역할특성의 하위개념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는 모두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직의도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호텔 종사자 등 클라이언트에게 대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내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요양현장의 최일선에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인력인 바(김소정, 2012),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조직 차원의 이직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받는 정보, 업무상 지원, 사랑과 관심이 있는 심리적 배려를 말한다. 즉,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감정이며,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서로 접근하여 원조해주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이는 직무수행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로서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방어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Hobfoll & Vaux, 1993).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직수준에서의 스트레스 예방관리전략 또는 조절변인으로 간주된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Kessler et al., 1985).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공통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상사의 지지 및 동료의 지지는 직장문화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고, 가족의 지지는 직무자율성의 스트레스요인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웅열, 2010). 또한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명숙, 고종욱(2012)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지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의 지원이 많을수록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소재 재가 노인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이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동료의 지원이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그리고 역할모호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화, 임왕규, 2011).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진유식(2009)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감정노동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정노동의 형태에 따라 조절효과는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내면행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촉진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었고, 정서노동의 하위요인인 보육교사의 내면행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내면행동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촉진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었다(김수연, 조혜진, 2015).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일, 2015).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영미 (2015)의 연구에서 상사지지는 내면행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던 반면, 표면행위와 상사지지, 내면행위와 동료지지, 표면행위와 동료지지 간의 관계에서 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또한 상사지지는 양심행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가 있었던 반면, 자율성과 상사지지, 자율성과 동료지지, 양심행동과 동료지지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한편, 역할갈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으나, 갈등의 형태에 따라 조절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소재 50개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시설의 요양보호사 290명을 대상으로 한 김명숙, 고종욱 (2012)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 중 상사의 지원이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 갈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고 상사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김진(2015)의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폭력경험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클라이언트 폭력경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윤명숙, 박은아(2012)는 외상경험과 음주행위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2013).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 소진, 감정노동, 갈등 등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 갈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 등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조직 내 갈등의 요인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 이직의도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요양보호사가 자발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서은희, 2002). 이에 대한 측정은 홍정영(2013)의 연구를 요양 보호사에 맞게 수정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개 응답범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직의도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908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조직 내 갈등
갈등은 개인 또는 조직과 집단 사이의 가치관, 목표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는 일련의 지각, 인식 및 행위를 포함한 적대적 대립의 과정이다(홍규선, 2004).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적 배분, 상황, 목표, 가치, 인지 등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조직 내부에서 겪는 심리적․행동적 측면 또는 양 측면에서 일어나는 대립적이거나 경쟁적인 상호작용 현상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Jehn(1995), Robbins(1983), 최웅, 김경호, 안동화 (2015)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역할갈등, 보상갈등, 감정적 갈등, 상호의존갈등, 의사소통갈등이라는 5가지 하위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구성요소들을 포괄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대상인 요양보호사와 가진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조직 내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하위차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역할갈등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상반된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상 요구되는 것과 실제 역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양립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Nielson, Carlson과 Lankau(2001)의 연구를 활용하고 요양보호사에 맞게 수정하여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보상갈등은 요양보호사가 임금, 승진, 대우, 이의제기 수렴의 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Price와 Mueller(1981)의 연구를 활용하여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감정적 갈등은 Jehn(1995)의 정의에 따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대인관계에 서의 양립불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긴장, 악의, 불쾌감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Jehn(1995), Pelled(1996)의 연구를 수정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상호의존 갈등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중에 요양보호사가 동료들과의 협조, 지원 등에 있어서 효율적인 일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백영미, 1994), 이에 대한 측정은 노재현(2005)의 연구를 활용하여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의사 소통갈등은 요양보호사가 동료 간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정보의 교환이 신속하지 못한 경우 또는 쌍방의 의견무시 정도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노재현(2005)의 연구를 활용하고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직 내 갈등의 측정을 위한 25개 지표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 내 갈등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역할갈등 .710, 보상갈등 .752, 감정적 갈등 .809, 상호의존갈등 .814, 의사소통갈등 .840으로, 신뢰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요양보호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받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한다(차우정, 2015).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Caplan과 그 동료들(1975)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간의 일상생활이 주로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사의 지지(관리자와 슈퍼바이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 등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상사의 지지는 Thomas와 Ganster(199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요양보호사에 맞게 수정하여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동료의 지지는 Thomas와 Ganster(1995) 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요양보호사에 맞게 수정하여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는 King, Mattimore, King과 Adams(199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한 24개 지표를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상사의 지지 .910, 동료의 지지 .905, 가족의 지지 .916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1년 이상 경력의 성인 남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표본선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 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사전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임의 선정한 5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월에서 2016년 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총 209개 노인 요양시설 중 10개 시・군 소재 22개 노인요양시설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중간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한 뒤 요양보호사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한 후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에 한해 무기명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반송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447부(회수율 93%) 중 경력 1년 미만자의 응답지 그리고 응답 누락정도가 심하거나 중심화 경향이 뚜렷하여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응답지 45부를 제외한 총 40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 특성에 대하여 SPSS WIN v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WIN v21.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v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와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최종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항목을 대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 내 갈등의 영향과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상호작 용항을 중심으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내 잠재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방법 중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다루는 사회적 지지 변수가 메트릭 변수이기 때문에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은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서 상호 작용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고 측정지표의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Jaccard & Wan, 1995). 구조모델 분석을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과 사회적 지지 사이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분석과 더불어 조직 내 갈등의 하위 요인별 사회적 지지의 개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표본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 보면, 남성 61명(15.2%), 여성 341명(84.8%)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 연령은 50.43세로, 50대 이상(64.4%), 40대(23.6%), 30대(7.5%), 20대(4.5%) 순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이 약 88%를 차지하였고 50대 이상도 과반을 넘었다. 교육 수준은 고졸(41.5%), 전문대 졸업(23.6%), 대학교 졸업 이상(10%), 중졸(6.0%) 순으로 나타났고, 고졸 이상이 7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형태는 2교대(12시간 근무)가 31.3%, 상시근무(09-18시)가 27.4%, 3교대(8시간 근무)가 20.9%, 2일 근무 1일 휴무가 4.5%, 격일제(24시간 근무) 2.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평균 48.64개월로, 1년 이상-5년 미만이 67.9%, 5년 이상-10년 미만이 27.1%, 10년 이상은 5.0%로 나타나 5년 미만이 과반을 넘었고,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38.94개월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48.8%, 3년 이상-5년 미만이 22.4%, 5년 이상이 21.1%, 1년 미만이 7.7%의 순으로 나타나 3년 미만 근무자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여 이직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57.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1.9% 순으로 나타나 200만원 이하가 약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생활비 책임정도는 약간(41.0%), 대부분(31.8%), 전부(21.9%), 책임지지 않음(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동기는 가정경제 도움(48.5%), 안정된 직업(18.2%), 보람을 얻기 위함(17.4%), 여가 및 사회활동 차원(7.5%), 사회적 필요(6.5%) 순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정의 생활비가 근로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31.4%에 이르는 보람과 사회활동 차원의 근무동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조직 내 갈등, 사회적 지지, 이직의도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조직 내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인 역할갈등, 보상갈등, 감정적 갈등, 상호의존갈등, 의사소통갈등 25개 항목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항목 중 동료지지의 1번 항목(p1)이 상사의 지지에 높게 적재되어(cross loading) 제거되었으며,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 등을 의미하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직의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 요인명 | 항목 | 비표준화값 | 표준화값 | S.E | C.R.(t) |
|---|---|---|---|---|---|
| 역할갈등 (RC) | r1 | .725 | 1 | ||
| r2 | .837 | 1.296*** | .087 | 14.979 | |
| r4 | .812 | 1.285*** | .092 | 13.957 | |
| r5 | .702 | 1.043*** | .083 | 12.568 | |
| 보상갈등 (CC) | c2 | .88 | 1 | ||
| c3 | .804 | .946*** | .047 | 2.312 | |
| c4 | .849 | .942*** | .047 | 19.879 | |
| 감정적 갈등 (EC) | e1 | .719 | 1 | ||
| e2 | .871 | 1.264*** | .076 | 16.551 | |
| e3 | .782 | 1.113*** | .075 | 14.821 | |
| e5 | .806 | 1.115*** | .073 | 15.28 | |
| 상호의존 | i1 | .843 | 1 | ||
| 갈등 (IC) | i2 | .772 | .919*** | .052 | 17.789 |
| i3 | .728 | .69*** | .044 | 15.813 | |
| i4 | .787 | .914*** | .051 | 17.919 | |
| i5 | .852 | .98*** | .049 | 19.962 | |
| 의사소통 갈등 (CoC) | cc3 | .722 | 1 | ||
| cc4 | .887 | 1.254*** | .078 | 16.139 | |
| cc5 | .806 | 1.212*** | .082 | 14.8 | |
| 상사지지 (BS) | b2 | .724 | 1 | ||
| b3 | .707 | 1.081*** | .078 | 13.844 | |
| b4 | .804 | 1.19*** | .076 | 15.683 | |
| b5 | .853 | 1.31*** | .079 | 16.519 | |
| b6 | .832 | 1.266*** | .079 | 16.093 | |
| b7 | .791 | 1.154*** | .075 | 15.4 | |
| b8 | .776 | 1.225*** | .082 | 15.015 | |
| 동료지지 (PS) | p3 | .807 | 1 | ||
| p4 | .767 | .959*** | .057 | 16.924 | |
| p5 | .729 | .928*** | .058 | 15.869 | |
| p6 | .803 | 1.046*** | .058 | 17.944 | |
| p7 | .801 | 1.112*** | .062 | 17.914 | |
| p8 | .795 | 1.031*** | .058 | 17.86 | |
| 가족지지 (FS) | f1 | .783 | 1 | ||
| f2 | .798 | 1.129*** | .065 | 17.386 | |
| f3 | .792 | 1.075*** | .063 | 17.09 | |
| f4 | .823 | 1.174*** | .066 | 17.792 | |
| f5 | .864 | 1.244*** | .065 | 19.07 | |
| f6 | .824 | 1.178*** | .065 | 17.996 | |
| f8 | .715 | .998*** | .066 | 15.097 | |
| 이직의도 (to) | t1 | .873 | 1 | ||
| t2 | .836 | 1.195*** | .056 | 21.232 | |
| t3 | .839 | 1.119*** | .052 | 21.443 | |
| t5 | .879 | 1.279*** | .055 | 23.422 |
가설 검증에 앞서 복수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Cronbach’s α값, C.R.(Construct Reliability)값과 AVE(Averaged Variance Extracted)값을 통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집중타당도를 확인하는 C.R.(Construct Reliability)값과 AVE(Averaged Variance Extracted)값을 활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에 적용된 변수의 항목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타당도가 확인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신뢰도 분석결과, 역할갈등 1개 문항(업무 수행상 업무지침 및 규칙 위반), 보상갈등 1개 문항(성과 및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 감정적 갈등 2개 문항(감정적 반응 영향, 신체적 위협이나 명령적 표현), 의사소통갈등 2개 문항(동료와 의사소통 곤란, 개인적 문제 동료와 상의 곤란), 상사의 지지 1개 문항(근무계획 변경), 동료의 지지의 2개 문항(업무수행 상의 조언, 업무 수행의 곤란 시 도움 제공), 가족의 지지 1개 문항(집안문제 처리 도움 제공), 이직의도 1개 문항(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 미실행)이 적재값(loading value)이 유의하지 않거나 오차분산(error variance)이 높게 나타나 제거되었다.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값은 .7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값과 C.R.값 또한 잠재변수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어 신뢰도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분석결과
| 구분 | 변수명 | 항목 수 | Cronbach’s α (>.6) | AVE (>.5) | C.R. (>.7) | |
|---|---|---|---|---|---|---|
| 최초 | 최종 | |||||
| 조직 내 갈등 | 역할갈등 | 5 | 4 | .710 | .638 | .875 |
| 보상갈등 | 4 | 3 | .752 | .704 | .765 | |
| 감정적 갈등 | 6 | 4 | .809 | .694 | 900 | |
| 상호의존갈등 | 5 | 5 | .814 | .664 | .908 | |
| 의사소통갈등 | 5 | 3 | .840 | .715 | 882 | |
| 사회적 지지 | 상사지지 | 8 | 7 | .910 | .643 | .926 |
| 동료지지 | 8 | 6 | .905 | .675 | .926 | |
| 가족지지 | 8 | 7 | .916 | .686 | .939 | |
| 이직의도 | 5 | 4 | .908 | .681 | .895 | |
한편,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ices: χ2, Q, GFI, RMSEA),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NFI, CFI, TLI), 간명적합지수(parsimony fit indices: PGFI, PCFI)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χ2값 이 1,224.258(df=808, p=.000)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χ2값이 표본 수와 측정변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χ2값의 대용치로 표준화 χ2값으로 불리는 Q값 (Normed-χ2 = χ2/df)을 통해 확인하였다. Q값에 대한 적합도 기준 값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Q값이 3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Q값이 1.515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GFI는 .877로 기준 값인 .90에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MSEA는 .036, RMR는 .043로 대체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NFI는 .883으로 기준에 조금 미흡하지만, CFI 는 .956, TLI는 .951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보여준다. 간명적합지수인 PGFI는 .749, PCFI는 .856으로 기준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며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 χ2(df)(>.05) | 1,224.258(808) p=.000 |
| Q(χ2/ df) (1-3) | 1.515 | |
| GFI(≥.9) | .877 | |
| RMR(≤.05) | .043 | |
| RMSEA(≤.6) | .036 | |
| AGFI(≥.8) | .856 | |
|
|
||
|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 NFI(≥.9) | .883 |
| CFI(≥.9) | .956 | |
| TLI(≥.9) | .951 | |
|
|
||
| 간명적합지수 (Parsimony Fit Index) | PGFI(≥.6) | .749 |
| PCFI(≥.6) | .856 | |
마지막으로 AVE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비교를 통해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는데, 분석결과 AVE 제곱근 값이 모든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고 있어서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오차 추정구간을 통한 판별타당도 검증결과에서는 조직 내 갈등과 사회적 지지 사이 표준오차 추정구간이 -.157~-.115,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 표준오차 추정구간이 -.109~-.057, 그리고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 표준오차 추정구간이 .166~.222로 표준오차 추정구간에서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기술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수로 투입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직 내 갈등 변수들은 이직의도와 모두 정(+)의 상관성을 가졌으며, 사회적 지지 변수들은 이직의도와 모두 부(-)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가설 방향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ID | 변수명 | 평균 | 표준 편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 역할갈등 | 2.60 | .77 | 1 | ||||||||
| 2 | 보상갈등 | 2.76 | .89 | .474** | 1 | |||||||
| 3 | 감정갈등 | 2.58 | .79 | .495** | .492** | 1 | ||||||
| 4 | 의존갈등 | 2.89 | .78 | .275** | .224** | .334** | 1 | |||||
| 5 | 소통갈등 | 2.37 | .79 | .424** | .428** | .634** | .351** | 1 | ||||
| 6 | 상사지지 | 3.41 | .78 | -.210** | -.325** | -.278** | .029 | -.241** | 1 | |||
| 7 | 동료지지 | 3.44 | .71 | -.227** | -.273** | -.357** | -.053 | -.377** | .652** | 1 | ||
| 8 | 가족지지 | 3.64 | .74 | -.196** | -.277** | -.354** | -.125* | -.380** | .518** | .640** | 1 | |
| 9 | 이직의도 | 2.77 | .85 | .406** | .412** | .605** | .243** | .498** | -.172** | -.211** | -.245** | 1 |
4. 연구결과
가.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한 다음, 조직 내 갈등 요인별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항목묶음을 통한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모델 분석결과, 조직 내 갈등 전반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β=.854,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친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갈등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 내 갈등 요인별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 내 갈등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조직 내 갈등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대한 구조모델의 분석결과는 역할갈등(β=.113, p=.008), 보상갈등(β=.125, p=.007), 감정적 갈등(β=.161, p=.005), 그리고 의사소통갈 등(β=.176, p=.007)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호의존갈등(β=.020, p=.641)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직 내 갈등 전반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정적 갈등과 의사소통갈등이 이직의도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조직 내 갈등 전반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한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델 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측치에서 표준평균을 차감하는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여 평균을 0으로 전환하였다. 조직 내 갈등 전반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직 내 갈등 전반과 이직의도 사이의 사회적 지지 형태별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내 갈등 전반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β=.474,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상사의 지지 (β=-.011, p=.866), 동료의 지지(β=.061, p=.385), 그리고 가족 지지(β=-.057, p=.368)의 이직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경우, 조직갈등*가족지지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정(+)의 효과(β=.142, p=.03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가족지지가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료의 지지는 조직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부(-)의 조절효과(β=-.121, p=.099)가 나타났으며, 상사지지(β=.018, p=.776)의 경우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2의 전반은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갈등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는 세부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직 내 갈등의 각 요인별로 사회적 지지 유형간의 조절효과를 구조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 내 갈등을 요인별로 분리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별 조절효과를 항목묶음을 구성하는 각 요인별로 분해하여 구조모델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역할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을 분석한 결과, 역할갈 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β=.327, p=.000)을, 가족지지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β=-.147, p=.02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역할갈등*상사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64, p=.310), 그리고 역할갈등*동료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52, p=.488), 역할갈등*가족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100, p=.128)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역할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보상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상갈등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의 분석결과, 보상갈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β=.312, p=.000)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변수들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보상갈등*동료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220, p=.006)과 보상갈등*가족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189, p=.00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조절효과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보상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동료의 지지가 강해지면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가족의 지지가 강해지면 이직의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갈등*상사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17, p=.79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 감정적 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감정적 갈등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의 분석한 결과 감정적 갈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β=.419, p=.000)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변수 모두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감정적 갈등*상사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46, p=.500), 그리고 감정적 갈등*동료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35, p=.629), 감정적 갈등*가 족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117, p=.090)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감정적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상호의존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호의존갈등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의 분석한 결과 상호 의존갈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β=.180, p=.000)을 미치며, 가족의 지지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β=-.144, p=.03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상호의존갈등*동료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208, p=.011)과 상호의존갈등*가족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243,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들의 조절효과의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상호의 존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동료의 지지가 강해지면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가족의 지지가 강해지면 이직의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갈등*상사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66, p=.3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 의사소통갈등과 이직의도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의사소통갈등과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항목묶음을 통한 구조모델 분석결과, 의사소통 갈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β=.391, p=.000)을 미쳤으나, 사회적 지지 변수 모두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의사소통갈등*동료지지(β=-.136, p=.064)와 의사소통갈등*가족지지(β =.133, p=.051)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동료의 지지가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완화되는 반면, 가족의 지지가 강해지면 이직의도가 더욱 높아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갈등* 상사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002, p=.97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이직의도 영향요인 중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갈등 관련 기존연구가 직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역할갈등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범위를 직무 외적 요소인 보상갈등과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갈등, 상호의존갈등과 의사소통갈등까지 확대하여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주로 단편적으로 수행되었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를 상사지지, 동료지미 및 가족지지로 다차원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모든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갈등(β=.176)과 감정적 갈등(β =.161)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β=.142)는 이직의도를 강화시키는 상승효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동료의 지지(β=-.121)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완충효과가 작용하였다. 셋째, 조직 내 갈등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의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역할갈등과 감정적 갈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유형 모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보상갈등, 상호의존갈등 및 의사소통갈등의 경우 동료의 지지는 이직의도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조절효과로 작용하는 반면, 가족지지는 이직의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로 작용하였다.
위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주로 역할갈등이나 직무스트레스 중심으로 다루어진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상호의존성 및 의사소통과 같은 갈등 요인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완충효과를 지니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조직 유형 혹은 사회적 지지의 원천과 연구의 대상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상이하였다. 즉, 상사지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상사의 지지가 직무에서 받은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유효한 방패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윤혜미, 1991)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동료지지는 이직의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모델(Cohen & Wills, 1985; Koeske & Koeske, 1990)이 동료지지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경우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부(-)적으로 작 용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나 논의와는 상이한 결과로 향후에도 조직 내 갈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Bolger 등(2000)의 논의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가족구성원과 같은 친밀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우호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고통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과잉 지지로 인한 업무 수행에의 방해, 과도한 정서적 영향, 가족의 과잉 관여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탈진(Ray & Miller, 1994) 또는 자아상실감(Iverson et al., 1998)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갈등 및 의사소통갈등 요인과 가족의 지지가 이직의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로, 상호의존성과 의사소통 맥락에서 오는 갈등과 가족의 지지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현상에 대한 향후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갈등해소 및 이직 관리를 위한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직의도에 의사소통 갈등과 감정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감안하여 관리자는 조직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성원 간에 상호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직장풍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개인이 이해관계자나 업무로 부터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창구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인간중심적인 관리 매뉴얼 개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및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상사의 지지 보다는 동료지지에 의한 갈등의 완충역할에 주목하여 여러 직종의 조직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상호지지, 그리고 조직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간중심의 팀 빌딩 교육 등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공감 및 지지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 등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패가 요양현장의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 특히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조직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갈등과 이직문제는 전적으로 요양시설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호봉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등 요양보호사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갈등, 이직의도,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직에서 갈등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를 경북의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국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 하위변수들의 조절효과가 조직 내 갈등 요인과 결과 변수들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에는 조직 내 갈등과 결과변수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을 달리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2013). 2013년 노인복지뉴스. http://www.kacold.or.kr에서 2013.4.14. 인출
, & (1981). A path-analytic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role conflict and ambigu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2), 417-424. [PubMed]
, , & (2000). Invisible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53. [PubMed]
, &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PubMed]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ubMed]
, & (1979). Job stress and employee behavio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3(3), 373-387. [PubMed]
, , &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PubMed]
, & (1990).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440. [PubMed]
, & (1981). A causal model of turnover for nur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3), 543-565.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1-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3-20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3-23

- 4055Download
- 2498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