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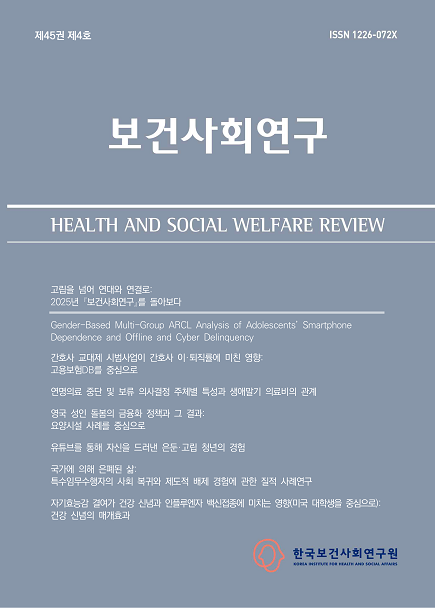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Estimating the Need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Park, Soo-Kyu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1, pp.495-514, March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495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the need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in general, and to estimate the need of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The assessment model was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formula, it is estimated that by 2020, terminally-ill Korean cancer patients will need 1,528-1,810 bed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suppl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을 개발하여 말기암환자 중심의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각종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의 방법론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유형별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정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은 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현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된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필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2년 노인질환 종합대책 및 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추진대책이 표명되어 2003~2004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암관리법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장윤정, 2012).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7년 8월 이후에는, 기존에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의 대상자가 말기암 환자 중심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지만, 고령화와, 급여정책 변화,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무분별한 자원공급은 보건의료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지역사회 건강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궁극적 목표(goal)인 질(quality), 형평성(equity), 반응성(responsiveness) 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과정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필요량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계획(capacity planning) 형태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Ettelt, Nolte, Thomson, Mays, and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omparisons Network, 2008, pp.1-6). Stjernswärd, Foley, Ferris(2007)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Public Health Model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로써, 적절한 정책과 약물 가용성 확보, 교육, 완화의료 서비스 구현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완화의료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서 적절한 자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전 연구(허대석, 2005, p.40; 경민호, 장유미, 한경희, 윤영호, 2010)에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량은 외국의 규범적 필요(needs) 수준인 인구백만명당 50병상을 적용하여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불체계에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념 등이 다른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도입, 장려되어 왔다(최정규, 태윤희, 최영순, 2015). 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불필요한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와 달리,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요구되는 입원시설과 병상자원은 다른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을 동반하여 발생시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계획과 필요량 평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 요량을 추정,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 고찰
1. 규범적 기준 적용에 따른 필요량 추정
보건의료자원의 필요량 추정에 있어 규범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선행 연구결과와 전문가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량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로 인구당 병상수 비율(bed population ratio)의 형태로 제시된다. 완화의료서비스 병상필요량과 관련하여 Doyle(2009, p.37)은 완화의료 시설형태를 병동형(Hospital Palliative Care Unit, HPCU)과 시설형(free-standing unit)으로 구분하고 시설형 사례에서 병상필요량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백만명을 기준으로 암환자(malignant disease)의 경우 400~700병상, 비암환자의 경우 200~700병상 적용을 권장하였다. Payne & Radbruch(2009)은 매해 유럽지역에서 1.6백만명은 암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32만명 이상의 암환자와 비암환자 28.5만명에게 전문 완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 중 완화의료병동(Palliative Care Units, PCUs) 필요량은 인구백만명당 50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후속 연구에서는 적용기준을 인구백만명당 80~100병상(25만명당 20~25병상)으로 확대하고 이 중 암환자는 25만명당 최소 12.5병상(2만명당 1개병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Radbruch & Payne, 2010). 가장 최근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완화의 료서비스가 필요한 목표 환자 비율을 암사망자의 60%, 비암환자 사망자의 30~60%로 제시한 바 있다(Gómez-Batiste et al., 2011, p.8).
국가별로도 규범적 기준에 따른 필요량 추정과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완화의료서비스 필요병상수 산정기준을 암환자 인구백만명당 52병상, 비암환자 인구백만명당 26병상을 적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구 25만명당 20~25병 상으로 그 기준을 상향적용하고 있다(The Northern England strategic clinical networks supportive, palliative & end of life care group, 2014, p.7). 뉴질랜드에서도 입원환자 완화의료병상 추정에 인구당 병상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비암질환을 포함하여 성인 인구십만명당 6.15병상이다(Naylor, 2013, p.21).
규범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자원필요량을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각 문헌마다, 국가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서비스 제공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해당하는 규범적 수준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2. 사망원인 기반의 필요량 추정
Higginson(1997, pp.1-28)은 완화의료 필요량 추정의 출발점을 사망자수로 정의하고, 완화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핵심 증상을 갖는 암과 비암성질환(순환기계, 호흡기계,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신경계, 감각기관계 등)의 사망자수를 기반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 따른 표준증상 발생률(standard symptom prevalence)을 곱하여 완화의료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Rosenwax, McNamara, Blackmore, Holman(2005)도 사망원인에 기반하여 3단계의 추정값을 제시하였는데, 최소 추정값은 암 및 비암성 질환 10개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 최대 추정값은 중독, 상해, 임신, 신생아, 주산기 사망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수로 제시한 바 있다. Gomez-batiste, Martinez-Munoz, Blay, Espinosa, Contel, Ledesma(2012)은 만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한 모든 사망자수의 75% 수준을 완화의료 필요량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Murtagh, Bausewein, Verne, Groeneveld, Kaloki, Hihhinson(2014)은 비암성 질환에 있어 역학자료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각 질환의 포함여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사망 증명서가 실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정확성이 결여되는 점, 사망전에 완화의료 필요에 대한 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사망원인 기반의 필요량 추정방법의 한계점을 정리한 바 있다.
3. 현 이용 양상 기반의 필요량 추정
미국은 주별 필요증명제도(certificate of need, CON)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시설이나 서비스의 신규 도입, 또는 확장 시에 규제당국에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호스피스 서비스는 미국 18개 주에서 CON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6),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CON 적용 방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워싱턴주, 메릴랜드주의 호스피스 필요량 산출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호스피스 입원시설(Hospice Inpatient Beds)에 대한 병상필요량 산정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
- 1단계: 환자거주 자치구(county)별 연간 호스피스 이용건수 집계
-
- 2단계: 환자거주 자치구(county)별 연간 총 이용일수 집계
-
- 3단계: 평균이용일수 산출(1, 2단계 기반)
-
- 4단계: 이전 3년간의 주 전체 호스피스 입원건수 통계량 기반, 연평균 증가율 산출
-
- 5단계: 1단계 자치구별 이용건수에 4단계 연평균증가율 적용, 자치구별 목표연도 호스피스 이용건수 추정
-
- 6단계a: 목표연도의 자치구별 총 이용일수 산출(3단계 평균이용일수×5단계 목표연도 호스피스 이용건수)
-
- 6단계b: 목표연도의 자치구별 총 이용일수 산출(주 전체 이용일수 중간값×5단계 목표연도 호스피스 이용건수)
-
- 6단계c: 6a 또는 6b 중 작은 값 선택
-
- 7단계: 목표연도 총 이용일수에 6% 적용
* 6%는 호스피스 중 입원시설 병상에 대한 분담률(규범적 적용)
-
- 8단계: 서비스 제공일수(365일) 및 병상이용률 (85%) 적용 호스피스 병상수 추정
-
- 9단계: 현 공급량과 비교
-
- 10단계: 현 공급기관의 병상이용률 검토
-
- 11단계: 현 병상이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9단계에서 부족으로 산출되더라도 신규 진입 불허
-
- 12단계: 6병상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는 자치구의 경우, 단일 자치구 단위 간주
워싱턴 주의 호스피스 서비스(Hospice Service)에 대한 필요량 추정단계는 다음과 같다(Washington state legislature, 2003).
-
- 1단계: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및 보건부 데이터 이용 호스피스 이용률 추정(최근 3년간 사망자 통계 기반, 65세 이상 및 미만, 암환자 및 비암환자 비율 산출)
-
- 2단계: 각 권역별 사망자수 집계
-
- 3단계: 호스피스 이용률(1단계) × 권역별 사망자수(2단계)
-
- 4단계: 각 권역별 호스피스 잠재 필요량 예측
-
- 5단계: 인구성장률 적용
-
- 6단계: 각 권역별 현재 호스피스 공급량과 잠재 필요량 비교를 통한 미충족 필요량(unmet need) 추정
마지막으로 메릴랜드 주의 호스피스 필요량(General Hospice Service Need) 예측방 법과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다(Maryland health care commission, 2013).
-
- 1단계: MedPAC(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에 따른 최근연도 미국 호스피스 이용률 기반 목표연도 이용률 추정 (a)
-
- 2단계: 메릴랜드 주통계 기반, 35세 이상 총 사망자수(baseline total population deaths) 도출
-
- 3단계: 메릴랜드 주통계 기반, 35세 이상 총 인구수(total household population) 도출
-
- 4단계: 목표연도의 총사망자수(target year total population deaths) 추정 (d)
-
- 5단계: 목표연도 총 필요량(target year gross need) 산출: (a) × (d) = (e)
-
- 6단계: 호스피스 이용자료 기반, 총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수(total hospice deaths) 산출 (f)
-
- 7단계: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 산출 (g)
-
- 8단계: 권역별 목표연도 호스피스 필요량(target year capacity) 추정: (f) × (g) = (h)
-
- 9단계: 권역별 목표연도 순필요량(target year net need) 추정: (e) - (h) = (i)
-
- 10단계: 주 전체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수 중간값 산출을 통한 최대허용값(volume threshold) 산출 (j)
-
- 11단계: 목표연도의 순필요량(i)이 최대허용값(j) 보다 크면, 새로운 호스피스 건립이나 기존 호스피스의 확장 허용
호스피스 서비스 필요량 산출과 적용방법은 주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연방 및 주별, 자치구별 호스피스 이용자수와 사망자수 통계량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통계량을 활용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탐색하고 목표연도 필요량을 추계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이었다. 다만 추계결과의 적용시에는 필요량 산출식에 따라 미충족 필요량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허가절차는 병상이용률 등을 다시 고려하는 등의 엄격한 적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1.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 개발
규범적 기준이나, 사망자수 기반의 필요량 추정이 비교적 간편하게 적용 가능한데 비하여 현 이용양상 기반의 필요량 추정은 관련 통계의 확보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미래 수요의 변화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이용 양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규범적 기준과 사망원인 기반의 필요량 추정방법에 비해 현 이용 양상 기반의 필요량 추정 방법이 비교적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은 미국 CON제도에서 사용하는 현 이용 양상 기반의 필요량 추정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출식을 제안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양상 기반의 병상필요량 산출은 목표 연도의 연간 신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추정값에 환자당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이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는 암사망자수와 암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실제 병상필요량 산출을 위한 각 요소 별 적용값은 <표 1>과 같다. 먼저 목표 연도의 연간 신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연도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추이를 기반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연평균 증가율을 목표 연도에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의 통계 산출이 가능한 과거 8년간의 증감률 양상과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률을 나타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률 양상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 하였다. 평균재원일수는 환자당 실제 병상을 이용한 일수로써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이용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인 22.4일을 적용하였다. 병상이용률은 병상이용이 항상 예측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여유분을 반영하는 의미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과밀화되지 않게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데, 보편적으로 규범적 수준을 적용한다(박수경, 좌용권, 조경미, 이신호, 김억수, 이예진, 2014, p.91). 참고로 2014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의 병상이용률은 68.2% 수준으로 추정되는데1), 이는 전체 병상의 31.8%가 비활용 병상임을 의미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적정 병상이용률의 기준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운영실적 평가기준에서 활용되는 ‘우수’기관의 해당 값인 80%를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p.46). 연간 입원진료일수를 의미하는 365일을 제외하면, 연간 암사망자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비율 뿐 아니라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한 지표들이다.
표 1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의 적용방법
| 요소 | 적용 |
|---|---|
|
|
|
| Ppc | (1) 관찰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연평균 증감률 산출 |
| (2) (1)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한 목표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산출 | |
|
|
|
| LOS | 22.4일(2014년도 입원환자당 평균재원일수) |
|
|
|
| BO | 80%(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운영실적 평가기준 중 ‘우수’기관 적용값) |
|
|
|
| 365 | 상수 |
2.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추이와 중단기 추계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써, 2008년 암사망자의 7.3%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암사망자수 76,855명 중 15.0% 가량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암센터, 2016). 다만, 증감률에 다소 변동이 존재하는데, 지난 8년간 국내 암사망자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연간 신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는 2010년까지 2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2011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로 인한 급격한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전년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증감률도 2013년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된다(표 2).
표 2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추이
| 연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 암사망자수 | 암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비율 | ||||
|---|---|---|---|---|---|---|---|
|
|
|
|
|||||
| N(A) | 전년대비 증감률 | N(B) | 전년대비 증감률 | 이용률 (A/B) | 전년대비 증감률 | ||
|
|
|||||||
| 2008 | 5,046 | - | 68,912 | - | 7.3% | - | |
|
|
|||||||
| 2009 | 6,365 | 26.1% | 69,780 | 1.3% | 9.1% | 24.6% | |
|
|
|||||||
| 2010 | 7,654 | 20.3% | 72,046 | 3.2% | 10.6% | 16.5% | |
|
|
|||||||
| 2011 | 8,494 | 11.0% | 71,579 | -0.6% | 11.9% | 11.7% | |
|
|
|||||||
| 2012 | 8,742 | 2.9% | 73,759 | 3.0% | 11.9% | -0.1% | |
|
|
|||||||
| 2013 | 9,573 | 9.5% | 75,334 | 2.1% | 12.7% | 7.2% | |
|
|
|||||||
| 2014 | 10,559 | 10.3% | 76,611 | 1.7% | 13.8% | 8.5% | |
|
|
|||||||
| 2015 | 11,504 | 8.9% | 76,855 | 0.3% | 15.0% | 8.6% | |
|
|
|||||||
| 연평균 증감률 |
8년 기반 | - | 12.7% | - | 1.6% | - | 11.0% |
|
|
|||||||
| 3년 기반 | - | 9.6% | - | 1.4% | - | 8.1% | |
최근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를 추정한 결과, 2020년경 연간 신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는 20~24천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 암사망자수는 83~84천명, 호스피스완화서비스 이용률은 23.9~27.9%로 추정되었다(표 3).
표 3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추계
| 연도 | 3년 기반 연평균 증가율 적용 | 8년 기반 연평균 증가율 적용 | ||||||
|---|---|---|---|---|---|---|---|---|
|
|
|
|
||||||
| 호스피스완화 의료입원 환자수 | 암사망자수 | 암사망자중 호스피스완화 의료 이용비율 | 호스피스완화 의료입원 환자수 | 암사망자수 | 암사망자중 호스피스완화 의료 이용비율 | |||
|
|
||||||||
| 2016 | 13,815 | 78,995 | 17.5% | 14,617 | 79,301 | 18.4% | ||
|
|
||||||||
| 2017 | 15,139 | 80,088 | 18.9% | 16,476 | 80,553 | 20.5% | ||
|
|
||||||||
| 2018 | 16,590 | 81,196 | 20.4% | 18,572 | 81,825 | 22.7% | ||
|
|
||||||||
| 2019 | 18,181 | 82,318 | 22.1% | 20,934 | 83,118 | 25.2% | ||
|
|
||||||||
| 2020 | 19,923 | 83,457 | 23.9% | 23,597 | 84,430 | 27.9% | ||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안)과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이용 추계결과를 기반으로 연도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병상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표 4).
표 4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계(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 연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 ||
|---|---|---|---|---|
|
|
|
|||
| 보수적 | 낙관적 | 보수적 | 낙관적 | |
|
|
||||
| 2016 | 13,815 | 14,617 | 1,060 | 1,121 |
|
|
||||
| 2017 | 15,139 | 16,476 | 1,161 | 1,264 |
|
|
||||
| 2018 | 16,590 | 18,572 | 1,273 | 1,425 |
|
|
||||
| 2019 | 18,181 | 20,934 | 1,395 | 1,606 |
|
|
||||
| 2020 | 19,923 | 23,597 | 1,528 | 1,810 |
Ⅳ. 고찰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needs)는 개인의 의료이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평가(need assessment)하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McIlfatrick, 2007). Bradshaw(1972, pp.1-12)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필요(needs)를 규범적 필요(normative need)와 인지된 필요(felt need), 표출된 필요·수요(expressed need, demand), 비교에 의한 필요(comparative need)로 구분하였는데, 보건의료 필요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병상필요량 평가도구를 살펴본 결과, 국제기구와 유럽국가들은 주로 규범적 필요량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CON제도를 통해 표출된 필요의 형태인 현 이용량을 기반의 필요량 추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 외 사망원인 기반의 필요량 추정방법도 표출된 필요를 기반으로 완화의료 필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말기암환자에게 필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 이용 양상 기반의 필요량 추정방법, 즉 표출된 필요에 근거한 산출식을 개발하였고,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로 해당 병상필요량은 인구백만명당 30~36병상 수준으로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백만명 당 50병상’ 기준의 약 60~72% 수준에 해당한다. 2016년 10월 현재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지원기관)은 전국 75개소, 1,268병상으로(국립암센터, 2016) 2017년의 낙관적 필요량 추계결과인 1,264병상을 초과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수는 2008년 282개에서 2015년 1,100개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6.2%에 달한다(국립암센터, 2016). 동기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이 결과 병상이용률이 68.2% 수준으로써, 실제 전국적으로 350여개(31.8%)의 병상은 유휴병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의 공급은 그 필요와 수요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투자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의 대상을 암환자에 국한하여 추정함에 따라 다소 과소추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연명 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인해 2017년 8월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자가 말 기암 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교적 뚜렷한 기능변화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암환자와 달리 장기부전, 치매 등 다른 질병들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시기를 예측하기 힘듦에 따라(Joanne, 2001), 그 수요나 필요도 평가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비교적 정착된 유럽에서도 호스피스완화 의료서비스 대상자 중 암환자의 구성비가 아일랜드 76%,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80%, 벨기에 82%, 헝가리 89%,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독일, 영국의 경우 95% 등으로 (Centeno, Lynch, Donea, Rocafort, Clark, 2013) 비암환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향후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뿐 아니라 병상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형, 자문형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유형이 다양화되는 점 등의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병상의 필요량 추계에서 과거의 암사망자수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 추세를 중단기적 미래에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5.8%를 차지하는 등(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p.302) 인지된 필요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완화의료서비스 요구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인지된 필요와 표출된 필요· 수요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암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률은 2014년 기준 13.8%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편이었고,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기관의 병상이용률도 68.2%로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또한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호스피스’ 또는 ‘완화의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28.4%이었으며, 원하는 임종장소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응답한 경우는 23.0%에 불과한 점 등(장윤정, 2013, p.82) 여전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실제 2015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지만, 급격한 서비스 이용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막상 죽음에 직면할 경우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마지막까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등 현실과 이상적인 임종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완화의료는 인지된 필요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된 필요와 표출된 필요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 일반적으로 생애말기의 보건의 료서비스 이용 결정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의 영향이 큰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미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환자와 가족간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대화가 드물고 종교적, 문화적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본, 중국 등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mer, Melberg, Fowler, 2016). 우리나라의 임종문화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호스피스완 화의료 이용과 관련된 실증적 추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도 반영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중단기적 병상필요량 추정에 적합한 적용방법으로 판단된다.
셋째, 병상의 필요량 추계에서 암사망자수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환자수는 과거 추세를 반영한 반면,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은 고정값을 사용하였다. 평균재원일수 의 경우 암환자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가장 최근의 이용행태를 반영하였다. 병상이용률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이용률 추정값이 68.2%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적용값은 80%로 규범적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현재의 병상이용률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31.8% 의 잉여 병상수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병상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병상이용에 대한 여유분을 반영하되, 환자 안전 측면에서 과밀화되지 않는 적정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80%의 규범적 수준을 적용하였다. 연간 암사망자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비율 뿐 아니라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도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이러한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병상필요량은 전국적 추계결과로써 지역단위별 필요량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단위를 고려한 추계결과가 필요하나, 2015년 7월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점 등 현재 지역단위별 병상필요량 추계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별 서비스 이용양상과 공급의 수준 등에 대한 상세자료 산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반영한 세분화된 필요량 추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이 과거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복합 만성 질환으로 전환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Hammer, Melberg, Fowler, 2016). 이렇듯 국가적으로 호스 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확대의 형태가 반드시 입원서비스, 즉 병상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원서비스는 대표적 공급민감서비스(supply-sensitive care)로 구분되는데, 병상공급과 입원이용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병상공급이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잉 이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sher, Goodman, Skinner, Bronner, 2007). 반면 병상공급과 입원서비스 이용 및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지역별 변이분석에서 반드시 공급량 또는 이용량이 많거나 보건의료지출이 많은 것이 서비스 이용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Fisher et al., 2000). 우리나라 병상자원 정책은 사실상 무계획과 무정책으로 과잉 공급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공급 정책은 필요량 파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기반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량 기반의 보건의료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Ettelt, Nolte, Thomson, Mays, and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omparisons Network, 2008, pp.1-6).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말기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들의 인식전환에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모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갖는 의료기관 병상 확충 정책은 필요량 파악과 서비스 제공계획에 기반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병상확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환자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 수요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2016.10.6).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 http://hospice.cancer.go.kr/home/contentsInfo.do?menu_no=443&brd_mgrno=에서 2016.10.11. 인출
. (2016.12.27).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정 현황. http://hospice.cancer.go.kr/home/contentsInfo.do?menu_no=443&brd_mgrno=에서 2016.10.28. 인출
. (2015.8.24).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2015).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24978&page=1에서 2016.10.11. 인출
, , , , & (2013). EAPC Atlas of Palliative Care in Europe. http://www.pavi.dk/Files/EAPC%20Atlas%20of%20Pallaitive%20Care%20in%20Europe%202013%20webudgave.pdf에서2016.10.6. 인출
, & (2009). Getting Started: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those Starting a Hospice. Palliative Care Service 2nd Edition. http://hospicecare.com/uploads/2011/9/IAHPC_Getting_Started_2nd_ed.pdf에서 2016.10.6. 인출
, , , , & (2008). Capacity planning in health care;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1-6. http://www.euro.who.int/_data/assets/pdf_file/0003/108966/E91193.pdf에서 2016.10.6. 인출
, , , & (2007). Dartmouth Atlas Project Topic Brief-Supply-Sensitive Care. http://www.dartmouthatlas.org/downloads/reports/supply_sensitive.pdf에서 2016.10.6. 인출
, , , , , , et al. (2011).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alliative care programmes and services with a public health WHO perspective. http://ico.gencat.cat/web/.content/minisite/ico/professionals/documents/qualy/arxius/doc_pc_public_health_programmes.pdf에서 2016.10.6. 인출
, , , , , & (2012). Identifying needs and improving palliative care of chronically ill patients: a community-oriented, population-based, public-health approach. Curr Opin Support Palliat Care, 6(3), 371-378. [PubMed]
(2001). Serving patients who may die soon and their families: the role of hospice and other services. JAMA, 285, 925-932. [PubMed]
(2013). State health plan for facilities and services: hospice services COMAR 10.24.13. http://mhcc.maryland.gov/mhcc/pages/hcfs/hcfs_shp/documents/shp_chapter_10_24_13.pdf에서 2016.10.6. 인출
(2007). Assessing palliative care needs: views of patients, informal care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J Adv Nurs, 57(1), 77-86. [PubMed]
, , , , , & (2014). How many people need palliative care? A study developing and comparing methods for population-based estimates. Palliat Med, 28(1), 49-58. [PubMed]
(2016). Certificate of Need: State Health Laws and Programs. http://www.ncsl.org/research/health/con-certificate-ofneed-state-laws.aspx에서 2016.10.6. 인출
(2013). Palliative care council of New Zealand. National health needs assessment for palliative care phase 2 report: Palliative care capacity and capability in New Zealand. http://www.moh.govt.nz/notebook/nbbooks.nsf/0/6454677DAA4FBD2ECC257B8C0077A3CE/$file/national-health-needs-assessment-for-palliative-care-jun13.pdf에서 2016.10.6. 인출
(2015). North Carolina 2015 state medical facilities plan. https://www2.ncdhhs.gov/dhsr/ncsmfp/2015/2015smfp.pdf에서 2016.10.6. 인출
, , , & (2005). Estimating the size of a potential palliative care population. Palliat Med, 19(7), 556-562. [PubMed]
, , & (2007). The Public Health Strategy for Palliative Care. J Pain Symptom Manage, 33(5), 486-493. [PubMed]
(2014). NHS England population based needs assessment for specialised palliative care. http://www.nescn.nhs.uk/wp-content/uploads/2015/02/Population-Needs-Assessment-Report-20143.pdf에서 2016.10.6. 인출
(2003). Hospice services-standards and need forecasting method (WAC 246-310-290). http://app.leg.wa.gov/wac/default.aspx?cite=246–310-290에서 2016.10.11. 인출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6-10-1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1-0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1-06

- 4512Download
- 2795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