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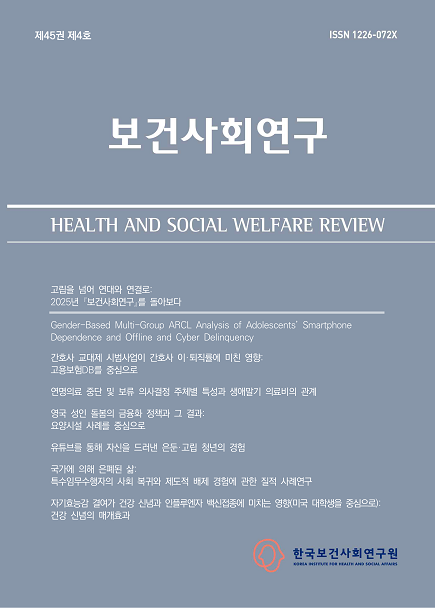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영양소섭취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in the Elderly: Focusing on Nutrient Intake
Kim, Min Ji; Lim, Jae Young*
보건사회연구, Vol.37, No.4, pp.125-145, Dec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125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노인 건강 및 여가활동 문제, 사회 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 등 여러 노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김승곤, 2004, pp.121-139).
인구 고령화와 관련되어 조명 받고 있는 여러 분야 중 식품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의식주 차원의 기본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식품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필요 영양소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용호 등, 2014, pp.112-133).
“2014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는 51.0%는 양호한 수준이고, 28.8%는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에 따르면 6~11세는 4.3%, 12~18세는 14.9%, 19~29세는 15.4%, 30~49세는 9.3%, 50~64세는 5.9%,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7.0%에서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대부분 소득 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섭취 문제가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에서의 영양섭취문제가 건강불평등 현상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인식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영양 불균형은 고령층의 건강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며, 노인 건강 문제 중에서도 만성질환 문제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나 노인 자신의 후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승곤, 2004, pp.121-139).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각 상실, 소화 흡수력 저하 등 신체적, 생리적 노화와 노인 단독세대,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수입저하, 교통수단 제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식품선택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더 나아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장재선 등, 2015, pp.1056-1064), 사회 계층 간 건강 불평등 현상은 소득 불평등 문제나 빈곤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 불평등’ 현상은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에만 관심을 두는 생의학적 관점으로부터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되기 보다는 개인의 지각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상대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이미숙, 2009, pp.5-32).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건강수준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개인 간 상대적인 건강수준의 격차가 점차 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House, 2002, pp.125-142).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 사회학 및 의학의 발전은 건강 및 질병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변화 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 양극화와 함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도와 격차로 국민 내 건강수준과 위험요인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식생활 또한 예외는 아니다(김기랑 등, 2008, pp.667-681). 특히 인구 구성 면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노인집단의 경우 노화와 함께 복합적인 여러 이유로 식품 섭취가 감소하여 영양상태가 불량해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 감소, 만성질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어느 연령집단보다도 건강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영양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윤진숙 등, 2002, pp.539-547).
다시 말해 이전까지 건강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혹은 유전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보건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김진영, 2007, pp.127-153).
특히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양소섭취를 전술한 그 기전중의 하나로서 염두에 두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연결 지어 고찰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강은정(2007, pp.409-425)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 장애율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령 및 기타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 장애율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보다는 만성질환 등의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김진영(2007, pp.127-153)은 교육수준, 소득, 생활수준과 만성질환 이환 여부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 집단이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 수준의 건강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승곤(2004, pp.155-177)에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만성질환 유병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유병률이 남녀 모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불평등 현상의 존재 여부를 탐색 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 유병률이라는 요인을 이용하여 탐색하고자한다. 이를 종합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 유병률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건강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다(보건복지부). 제6기(2013~2015) 조사는 총 576개 조사구에서 11,5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품섭취조사와 이와 관련된 요인이 포함된 영양조사와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중 결측치를 제외한 남성 522명, 여성 661명 총 1183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이 연령대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7%에서 영양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장년에 해당하는 30~49세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통제변수로 인구통계변수(성, 나이, 동거여부)와 건강행위변수(운동,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 시켰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 여부, 경제활동 여부를 선택하였다.
표 1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 변 수 | 정 의 | 평균 | 표준편차 |
|---|---|---|---|
| 성별 | 남=1, 여=0 | 0.44 | 0.50 |
| 나이 | 분석대상 연령(연속변수) | 72세 | 4.88 |
| 동거여부 | 가구원 수(연속변수) | 2.3명 | 1.14 |
| 운동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실천=1, 비실천=0 | 35% | 0.48 |
| 음주 | 음주=1, 금주=0 | 36% | 0.48 |
| 흡연 | 흡연=1, 금연=0 | 0.9% | 0.29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 보통=1, 나쁨, 좋음=0 | 23% | 0.42 |
| 좋음=1, 나쁨, 보통=0 | 46% | 0.50 | |
| 교육 (초등) | 중등=1, 초등, 고등 이상=0 | 14% | 0.34 |
| 고등=1, 초등, 중등=0 | 26% | 0.44 | |
| 소득1) (하) | 중=1, 하, 상=0 | 51% | 0.50 |
| 상=1, 중, 상=0 | 25% | 0.43 | |
| 주택소유 | 소유=1, 비소유=0 | 74% | 0.44 |
| 경제활동 | 활동=1, 비활동=0 | 34% | 0.47 |
| 영양소 섭취 | 총 7가지 영양소(연속변수) | 2.2개 | 1.74 |
| 만성질환 | 유병=1, 무병=0 | 89% | 0.31 |
만성질환 유병여부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 값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값을 지정하였다.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병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질환이 연령이 증가되면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민건강조사(National Health Survey)에서는 만성질환을 실제 이환기간에 관계없이 질병의 자연사적 특징에 따라 34가지 질환을 만성병으로 분류하였다(서미경, 1995, pp.28-39). 본 연구에서는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만성질환 중 결측치를 제외한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관절염, 류마티스, 골다공증, 폐결핵, 천식, 당뇨, 갑상선,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 중이염, 백내장, 녹내장, 간경변증 총 21개 만성질환의 유무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 89%가 만성질환 중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변수로 사용된 7가지 영양소는 에너지(Kcal/일), 단백질(g/일), 지용성 비타민A(mg/일), 수용성 비타민C(mg/일), 칼슘(mg/일), 탄수화물, 지방이다. 각 영양소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3대 영양소 외에도 비타민A와 비타민C, 칼슘과 같은 부영양소가 결여될 경우 면역력이 감퇴하여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적절한 섭취는 건강에 있어 시력감퇴, 노인성 난청 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은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및 상한섭취량으로 구성되는데(이용호 등, 2014, pp.112-133)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2015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에 명시된 주요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및 섭취기준을 토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A, 비타민C, 칼슘의 각 섭취 기준1)에 충족하면 1의 값을, 과잉 혹은 부족일 경우 0의 값을 지정하였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별 영양소 섭취의 비교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의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분석하였다. 7가지 영양소 섭취 변수 중 평균 2.2개의 영양소가 섭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소별로는 에너지의 경우 응답자중 40%, 단백질은 53%, 지방 34%, 탄수화물 16%, 비타민A 30%, 비타민C 16%, 칼슘 10%가 영양소 섭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부족 보다는 과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식품 섭취가 탄수화물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한국인의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열량)의 경우 20대 젊은 층은 남성 2,600(Kcal), 여성 2,100(Kcal)과 65세 이상 고령 층 남성의 경우 2,000(Kcal), 여성 1,600(Kcal)로 필요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단백질과 비타민A 또는 비타민C의 경우 젊은 층과 고령층의 권장섭취요구량 차이는 미미하거나 차이가 없다(이용호 등, 2014, pp.112-133).
2. 연구모형(Methodology)
연구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Model Ⅰ)은 영양소섭취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양소섭취 변수는, 총 7개 영양소의 권장섭취량 충족 여부에 따라 0~7까지의 값을 가지는 순서형 종속변수이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서형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또는 순서형 프로빗분석(Ordered probit model) 등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이상호 등, 2011, pp.101-115).
순위화된 종속변수의 다항 선택성 및 이산성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귀식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2). 식 (1)은 순위 로짓모형을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순위화된 종속변수 y*와 설명변수 xk의 관계로 가정한다.
식 (1)은 순서화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차항 ϵ은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y*는 잠재변수로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로 관찰 가능한 y 와의 관계는 식 (2)와 같다.
여기서 μj 는 설명변수의 β 와 함께 추정되는 경곗값(Threshold)을 의미하며, J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들 가운데 특정한 응답 j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 때, 용이한 회귀분석을 위해 μ1 = 0으로 정규화(Normalization)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영양소섭취 범주는 0~7로 총 일곱 가지 범주 중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응답자의 영양소섭취 정도는 개인의 영양소섭취 정도에 따라 일정한 구간 안에 있게 된다.
주어진 순서형 범주 값에서 j 가 선택될 확률 즉, y = j 를 가질 확률 prob (y = j)는 식 (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누적분포함수의 성질로부터 확률 값이 도출된다. 여기에서 F는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내며, 벡터 β 와 μ는 최우추정법(MLE)에 의해 추정된다.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위해 설명변수들 간의 한계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 (5)와 같이 해당 설명변수로 1계 편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Model Ⅱ)은 첫 번째 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영양소섭취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만성질환 유병여부가 질환을 보유할 경우 1, 질환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산변수이기 때문에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식 (6)에서 y*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로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Response Variable)미며, y*는 일반적으로 y*> 0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다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의 추정을 위해 STATA 14.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양소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 유병률간에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의 이질성이 만성질환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단계에서 얻는 추정결과를 2단계 추정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영양소섭취를 매개변수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만성질환 유병률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영양소섭취의 관련성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와 영양소섭취 간에 관련성을 분석한 첫 번째 모형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인 교육, 소득, 주택소유여부, 경제활동여부 변수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영양소섭취의 관련성
| 구분 | 회귀계수 | Std. Err |
|---|---|---|
| 인구통계변수 | ||
| 성별 | -0.005 | 0.12 |
| 나이 | -0.085*** | 0.01 |
| 동거 여부 | -0.037 | 0.14 |
| 건강행위변수 | ||
|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 0.293** | 0.15 |
|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 0.063 | 0.12 |
| 사회・경제적지위변수 | ||
| 교육1(중학교 이상) | 0.405** | 0.16 |
| 교육2(고등학교 이상) | 1.071*** | 0.14 |
| 소득1(중) | 0.257* | 0.13 |
| 소득2(상) | 0.255 | 0.16 |
| 주택소유 여부 | 0.340*** | 0.13 |
| 경제활동 여부 | 0.137 | 0.12 |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영양소섭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소득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영양소섭취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두 번째 모형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런데 영양소섭취의 경우,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섭취를 나타내는 변수를 그대로 두 번째 모형에 사용 할 경우 내생성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소섭취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첫 번째 모형에서 추정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모형 1과 모형 2의 추정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형 2에 건강행위 변수인 운동, 음주, 흡연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가 변수들의 경우 영양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변수의 경우 개인의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만성질환 보유 정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형 2의 식별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 구분 | 회귀계수 | Std. Err |
|---|---|---|
| 인구통계변수 | ||
| 성별 | -0.892*** | 0.25 |
| 나이 | 0.146*** | 0.06 |
| 동거 여부 | 0.005 | 0.28 |
| 건강행위변수 | ||
| 운동 | -0.358* | 0.20 |
| 음주 | 0.125 | 0.22 |
| 흡연 | -0.104 | 0.31 |
|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 -1.953*** | 0.36 |
|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 -1.070*** | 0.32 |
| 사회・경제적지위변수 | ||
| 교육1(중학교 이상) | -0.397 | 0.39 |
| 교육2(고등학교 이상) | -0.757 | 0.57 |
| 소득1(중) | -0.430 | 0.61 |
| 소득2(상) | -0.527 | 0.34 |
| 주택소유 여부 | -0.309 | 0.35 |
| 경제활동 여부 | -0.437* | 0.22 |
| 영양소섭취 | -8.029** | 3.98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변수들이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첫 번째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소섭취가 잘되고, 이에 따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경제활동 여부, 주택소유 여부 또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영양소섭취가 잘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유병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영양소섭취변수의 계수 추정치 역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영양소섭취가 미흡할수록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의 변수들을 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금주를 하는 사람일수록 만성질환 유병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여부 인데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영양소 섭취에 차이가 있으며 만성질환 유병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양소섭취도 잘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보유할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결과의 적합도 분석
본 부분에서는 앞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가지의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유무가 아닌 개수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7대 영양소섭취가 아닌 3대 주영양소 섭취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만성질환 개수를 활용한 추가 분석 결과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성질환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 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은 만성질환의 보유여부만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이었지만, OLS를 이용한 추가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OLS분석 결과 기존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의 개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모형 1, 모형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
만성질환 OLS결과
| 구분 | 회귀계수 | Std. Err |
|---|---|---|
| 인구통계변수 | ||
| 성별 | -1.052*** | 0.14 |
| 나이 | 0.106*** | 0.03 |
| 동거 여부 | -0.014 | 0.05 |
| 건강행위변수 | ||
| 운동 | -0.154 | 0.12 |
| 음주 | -0.158 | 0.13 |
| 흡연 | -0.214 | 0.20 |
|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 -2.099*** | 0.18 |
|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 -1.119*** | 0.13 |
| 사회・경제적지위변수 | ||
| 교육1(중학교 이상) | -0.332 | 0.22 |
| 교육2(고등학교 이상) | -0.604* | 0.31 |
| 소득1(중) | -0.195 | 0.17 |
| 소득2(상) | -0.100 | 0.20 |
| 주택소유 여부 | -0.307 | 0.12 |
| 경제활동 여부 | -0.349** | 1.13 |
| 영양소섭취 | -5.737** | 1.95 |
나. 3대 영양소섭취를 활용한 추가분석 결과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고, 섭취 된 영양소를 생활하면서 에너지로 소모 하게 되며 이를 “대사량”이라고 한다. 대사량은 기초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기초대사량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대사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사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1일 기초대사량은 2000(kcal)이며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1600(kcal)이다.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있다. 3대 영양소의 에너지 균형을 PFC발란스(Protein, Fat, Carbohydrate) 라고 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음식물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소 섭취와 관련하여 7대 영양소섭취 정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추가로 3대 영양소섭취만으로 변수를 새로이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즉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의 경우 총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적절한 섭취비율, 즉 에너지적정비율을 이용하여 에너지적정비율(%) 내에 속하는 경우 1, 과잉 혹은 부족일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고 단밸질의 경우 권장섭취량을 넘을 경우 1, 넘지 않을 경우 0의 갑을 부여 하여 총 0~3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3대 영양소섭취
| 구분 | 회귀계수 | Std. Err |
|---|---|---|
| 인구통계변수 | ||
| 성별 | 0.069 | 0.13 |
| 나이 | -0.021* | 0.01 |
| 동거 여부 | -0.035 | 0.06 |
| 건강행위변수 | ||
|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 0.160 | 0.17 |
|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 -0.097 | 0.14 |
| 사회・경제적지위변수 | ||
| 교육1(중학교 이상) | 0.555*** | 0.18 |
| 교육2(고등학교 이상) | 0.479*** | 0.16 |
| 소득1(중) | 0.375** | 0.15 |
| 소득2(상) | 0.328* | 0.19 |
| 주택소유 여부 | 0.051 | 0.14 |
| 경제활동 여부 | 0.055 | 0.13 |
분석 결과 7가지 영양소섭취를 종속변수로 했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양소섭취가 좋아지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아울러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양소섭취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도 영양소섭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7대 영양소는 주영양소 뿐만 아니라 부영양소를 포함한 결과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영양소섭취를 살펴보면 탄수화물과 같은 특정 영양소섭취의 과다현상을 볼수 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주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만 한정하여 분석을 다시 하였다.
Ⅳ. 결론 및 고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기존 여러 연구에서 종종 다루어졌으나 한국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관계를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영양소섭취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고 더불어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만성질환 유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변수와 건강행위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 여부, 경제활동 여부를 이용하여 순위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중 교육수준에 따라 영양소 섭취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3대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도 첫 번째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양소 섭취가 좋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나 주택소유여부, 경제활동여부 또한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 유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노인의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한 소득의 차이,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정보 활용의 차이 등(김동배 등, 2012, pp.117-142)과 함께 영양소 섭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수준과 함께 다양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생애주기 중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간에는 역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있고, 노인의 건강은 과거의 축적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나이에 미래의 나쁜 건강이 예측되어 교육에 투자를 줄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유병률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김승곤, 2004, pp.155-177).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의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 고령자의 권장섭취량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이용호 등, 2014, pp.112-13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의 증가는 고령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문제나 빈곤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김승곤, 2004, pp.155-177).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미래 노인인구들의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근본적인 조건과 자원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정책과 개입이 요구된다(김진영, 2007, pp.127-153).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올바른 생활습관의 유지만으로도 유병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질환이며,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다(서미경, 1995, pp.28-39). 본 연구 결과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소 생활습관에 있어 영양소섭취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건강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실제로 영양식품을 구입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김승곤, 2004, pp.155-177).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에 맞춰 실질적으로 영양소섭취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노인의 만성질환에 미치는 요인을 밝힘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만성질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 즉 식품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설명변수가 만성질환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Notes
References
(2002).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st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25-142.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07-26
- 수정일Revised Date
- 2017-09-13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09-27

- 3453Download
- 3762Vie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