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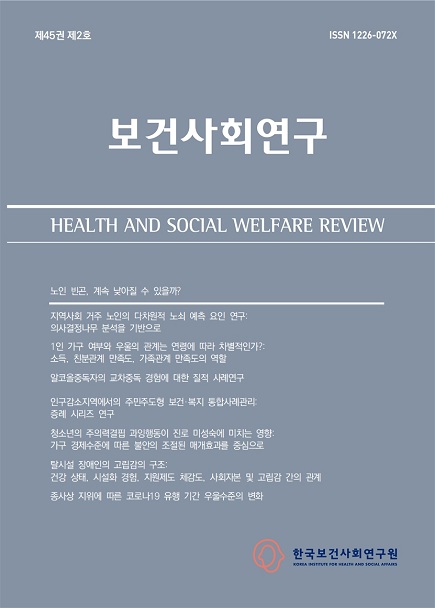 ISSN : 1226-072X
ISSN : 1226-072X
한국 자살 위험의 지역적 격차와 그 시공간적 고착 구조에 관한 연구
The Regional Gap of Suicide Risk and the Spatio-Temporally Persistence Structures in South Korea
Roh, Beop-Rae
보건사회연구, Vol.37, No.4, pp.213-237, December 2017
https://doi.org/10.15709/hswr.2017.37.4.21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 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의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분포에서 지역 간 고착 구조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자살에 있어 지역 간 고착 구조가 존재한다면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다는 단순한 기술적 서술을 넘어서 그와 같은 높은 자살률을 야기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지역이라는 차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 발생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 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을 보인다면 자살이 개인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와 환경이 깊숙하게 관여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현재 10만 명당 29.1명이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에 해당한다(OECD, 2016).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지난 20여 년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북유럽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들이 OECD 평균 이하의 자살률로 빠른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자살률이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노법래, 2017). 또한 한국은 지난 20여년 간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가 빠르게 변동하는 특이성을 보인다(노법래, 2013). 이런 특이성은 한국 사회의 자살 위험이 사회적 변동과 환경적 특성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살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지역 간 자살률의 차이(intra-country variations)를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이상영 등(2014)은 이와 관련한 주요 실증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한 지역임을 관찰하고 있어 지역 간 자살 위험의 종단적 고착 구조의 존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의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의 평균적 영향력의 규명에 주안점을 둔 연구는 다수 있어왔으나,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의 시공간적 패턴을 공간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패턴과 지역적 고착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50여개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하여 크게 두 단계의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연령별 자살 발생의 공간적 불균등 양상에 대해 공간 집적 수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시기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자살 발생의 지역 간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살 발생의 지역간 궤적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할 것이다. 이 때, 한 지역의 연령별 자살률을 동시에 포함하는 결합 궤적 유형화를 중심으로 지역 간 종단적 변화를 비교할 것이다. 이런 방법론적 시도는 시간, 지역, 연령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간 자살률의 시공간적 패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문헌검토
자살 발생의 국가 내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연구들은 자살 위험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중요한 공간적 특성으로 지역의 낙후 수준(deprivation)과 해체 수준(fragmentation)을 들고 있다(Chang et al., 2011; Congdon, 1996; Middleton et al., 2004; Rezaeian, Dunn, St Leger, & Appleby, 2005). 낙후된 지역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빈곤자가 다수 거주함에 따라 삶의 질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과 관련 투자가 결핍될 가능성이 크고(Smith, Hart, Watt, Hole, & Hawthorne, 1998), 개인 특성과 별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웃 효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Boardman, Finch, Ellison, Williams, & Jackson, 2001; Kuramoto, Wilcox, & Latkin, 2013; Latkin & Curry, 2003)에서 자살 위험과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가족 해체나 공동체의 붕괴를 동반한 지역의 해체 수준은 구성원의 삶의 질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자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Congdon, 1996; Middleton et al., 2004).
실증적 차원에서 도시화 수준, 지역 낙후 수준 및 고립 수준과 같은 공간적 특성과 자살률 간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자살 위험의 공간적 분포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패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들 연구는 주로 일반적으로 대도시 내에 분포하는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uramoto et al., 2013; Qi, Tong, & Hu, 2010). 일반적으로 낙후된 도심 지역은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약물 남용, 폭력 문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Goldstein, 1985; Johnson, Williams, Dei, & Sanabria, 1990).
한편, 대만, 중국, 홍콩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동아시아 연구들은 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 관찰과는 다소 다르게 도시 지역의 자살률은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는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 지역이 분포하는 공간적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hang et al., 2011; Phillips, Li, Zhang, & Eddleston, 2002). 동아시아 농촌 지역의 높은 자살률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들 지역이 사회문화적, 공간적, 심리적 차원에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통해 일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Hirsch, 2006).
분석 대상 지역에 따라 결과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서구의 도시 빈민가나 동아시아의 농촌 모두 앞서 제시한 지역적 낙후와 해체 수준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만 도시화, 산업화 등에 있어 서구와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이 이와 같은 지역적 패턴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회가 경험한 고유의 역사적 경험이 환경적 특성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리는 사회적 전이(social contagion), 집단적 사회화(collective socialization),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구성, 사회적 유대와 통제(social cohesion and control)의 영향, 경쟁(competition),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Galster, 2012) 자살 위험의 공간적 패턴을 수놓게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증 연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의 지역적 분포를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본 Qi(2010)는 1999년과 2003년의 두 개 시점의 호주 지역의 성별, 연령별 자살률 차이를 비교 검토했다. 분석 결과 호주 내에 성별, 연령별 자살률 고저가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나뉜다는 점을 관찰했다. 이 연구는 대체로 빈곤 수준이 높고 사회적 단절 수준이 높은 낙후된 도심을 중심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이 분포하는 공간적 패턴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Chang(2011)는 자살 위험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가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권역 자살 발생의 공간적 패턴이 서구와 다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내 358개 행정구역 간 자살률을 검토한 이 연구는 산악 지형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공간적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주로 낮은 중위 소득, 낮은 인구 밀도, 그리고 일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관찰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령 간 자살 발생의 공간 분포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자살률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산개해 있다고 보고했다. 도농 간 격차의 심화가 자살 위험의 공간 분포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 연구는 해석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동아시아 후발 국가들의 공통된 경험을 대만 사례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인 Hsu(2015)은 홍콩내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 발생의 공간적 패턴을 연구한 사례인데, 이 연구도 홍콩의 자살 발생이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홍콩의 경우 높은 빈곤 수준과 아울러서 독신 혹은 가족 해체를 경험한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 발생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빠른 수준의 가족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실증 연구와 자살 발생의 공간적 패턴의 존재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 발생의 패턴이 한 시점의 횡단적 관찰을 넘어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된 구조가 있는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을 중심으로 한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를 함께 다룰 것이다. 연령별로 나눠서 자살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자살률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를 지역 비교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irard(1993)는 한 사회의 산업화 수준과 이에 따른 문화적 변동에 의해 자살률의 연령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연령별로 차등적인 위험을 가져다 준다면 지역 자살 위험은 인구학적 구조 차이를 동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지역별 자살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살 사망자 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모든 자살 사망자를 시군구 단위로 취합하고 이를 통계청의 연령별 지역 인구 자료와 결합하여 연령별로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계산했다.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의 경우도 구 단위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기 따로 분석에 다뤄졌다. 일부 지역에서 조사 시기 내 지역 통합이 이뤄진 경우(예, 통합 창원시) 통합되기 이전 행정구역 구분을 활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경우는 대도시 지역으로 그외 시 단위 행정 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일반 도시 지역으로, 기타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단, 도농복합군으로 구성된 광역시의 경우 군 단위가 행정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따로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자살은 사망 원인이 각종 수단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분류된 경우(사인분류 코드, X600~X800에 해당)로 정의했다.
연령 구조를 다루는 연구에서 연령 집단의 구분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살과 같이 연령별로 위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고 생애주기와 관련한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타당한 연령 구분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연령 구간을 되도록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연령 구간이 많아질수록 분석 결과를 다루기가 복잡해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되도록 간명한 방식으로 연령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지역 간 상관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집단을 20대 이하, 30대~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세 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기로 한다.1)
2. 통계 분석
가. 공간 집적성: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인접한 공간의 속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관성을 의미하는 공간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Moran’s I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Wakefield et al, 2000). Moran(1948)에서 제시된 Moran’s I는 공간내 공분산을 표준화한 인접한 지역 간 밀접성과 관련된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공간의 인접선의 길이를 일반화한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Moran’s I는 두 공간의 속성 사이에 양의 상관성이 있으면 양의 값이, 그 반대의 경우는 음의 값이 도출되며 확률적 유의미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Moran’s I는 분석에서 다루는 공간 전체의 전역적(global)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국지적(local) 수준에서 산개하여 존재하는 자기상관은 local Moran’s I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개별 지역에 대한 local Moran’s I는 Moran's I를 각 지역별로 분해한 것으로 Moran’s I와 같이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Schabenberger et al., 2005; Wall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모란 산점도(Moran Scatterplot)을 활용하여 국지적 수준의 공간 자기상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자살 궤적 유형화: 결합궤적 분석(joint trajectory analysis)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결합궤적분석은 종단적으로 관찰된 두 개 이상의 연속 변수로 구성된 자료에 대해 k-means 군집분석의 속성 간 거리 계산 방식을 응용하여 유형화를 하는 다변량 시퀀스(sequence)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Genolini & Falissard, 2010). 이 연구에서 하나의 시퀀스는 한 지역의 특정 시기 및 특정 연령 집단의 자살률을 의미하게 된다. 지역별 자살 발생의 종단적인 패턴을 연령별로 측정된 복수의 자살률을 동시에 고려한 궤적 유형화를 시도하는 본 연구의 접근 방법상 결합궤적 유형화 기법의 활용이 유용하다.
유형화 연구에서 최적의 유형수를 검토하는 일률적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건 검토를 통해 결합궤적의 유형수를 결정하기로 한다. 첫째, Calinski-Harabatz(CH) 지수를 활용하여, 궤적의 유형수 변화에 따른 모형 적합도의 변화를 검토하기로 한다. 모형 선택과 관련해 CH값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해당 값이 클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Genolini & Falissard, 2010). 여기서는 유형화 모형 선택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바와 같이 유형수의 증가에도 모형 설명 수준이 둔화되는 조건을 선택하는 방식(elbow method)을 채택하고자 한다. 둘째, 유형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유형별 크기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유형수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작은 지역을 포함하는 유형이 도출될 경우 결과의 해석과 분석 결과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 크기의 밸런스는 가장 큰 유형의 케이스 수와 가장 작은 유형의 케이스 수의 비교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결합궤적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자살률의 종단적 패턴을 비교 검토한 뒤에는 궤적 유형이 공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매핑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결합궤적 유형이 지역 규모 및 행정 구역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연령별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 수준
[그림 1]은 연령별 자살률의 지역 간 격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자살률 하위 20% 지역과 상위 20% 지역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살자수가 적고, 지역별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많아 자살자 수의 작은 변화에도 비교적 큰 자살률 변화를 보이는 20대 이하의 경우 격차 수준에서 진폭(fluctuations)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다. 1998년 이후부터 약 2배 수준으로 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후로 다시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0대 이하 집단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진폭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2010년 이후로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특히 심화된 청년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역 간 차이를 두고 나타난 상황과 일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법래(2013)의 관찰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이후 20대 전후의 청년층의 자살률이 상승하는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관찰 결과와 종합하면 청년층 자살 위험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취약성을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0대~50대의 경우 2000년 전후로 2.5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가, 최근까지 2배 이하 수준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1998년에 3.5배를 넘는 격차를 보이다가, 점점 감소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약 2배 정도의 격차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살률의 지역적 격차가 2배 전후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자살 위험이 지역적으로 불균등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1998년에서 2000년 전후에서 관찰되는 높은 진폭은 경제 위기에 따른 충격이 지역적으로 높은 차별적 영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그림 1]의 분석 결과를 공간집적 수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 연령별 자살률의 시군구 수준에서 관찰한 공간적 집적 수준을 Moran’s I 값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표 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자살 위험의 공간적 집적 수준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간적 집적 수준이 시기에 걸쳐 더욱 명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 집단의 경우 분석 초기와 2012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간적 집적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30대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조사 시점 전체에 걸쳐서 Moran’s I값의 확률적 유의미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30대~50대의 경우는 조사시기에 걸쳐 통계적 유의미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집적수준의 크기에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집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자살률의 공간적 집적 수준의 변화
| 연도 | ~20s | 30s~50s | 60s~ | ||||||
|---|---|---|---|---|---|---|---|---|---|
|
|
|
|
|||||||
| I | p | sig | I | p | sig | I | p | sig | |
|
|
|||||||||
| 1998 | 0.10 | 0.01 | * | 0.28 | 0.00 | *** | 0.25 | 0.00 | *** |
| 1999 | 0.15 | 0.00 | *** | 0.31 | 0.00 | *** | 0.17 | 0.00 | *** |
| 2000 | 0.11 | 0.01 | ** | 0.23 | 0.00 | *** | 0.19 | 0.00 | *** |
| 2001 | 0.11 | 0.01 | ** | 0.33 | 0.00 | *** | 0.28 | 0.00 | *** |
| 2002 | 0.09 | 0.02 | * | 0.25 | 0.00 | *** | 0.18 | 0.00 | *** |
| 2003 | 0.23 | 0.00 | *** | 0.27 | 0.00 | *** | 0.32 | 0.00 | *** |
| 2004 | 0.08 | 0.03 | * | 0.26 | 0.00 | *** | 0.19 | 0.00 | *** |
| 2005 | 0.02 | 0.32 | 0.27 | 0.00 | *** | 0.27 | 0.00 | *** | |
| 2006 | -0.01 | 0.59 | 0.25 | 0.00 | *** | 0.28 | 0.00 | *** | |
| 2007 | 0.04 | 0.19 | 0.28 | 0.00 | *** | 0.31 | 0.00 | *** | |
| 2008 | 0.00 | 0.46 | 0.14 | 0.00 | *** | 0.29 | 0.00 | *** | |
| 2009 | 0.04 | 0.19 | 0.21 | 0.00 | *** | 0.33 | 0.00 | *** | |
| 2010 | 0.03 | 0.25 | 0.20 | 0.00 | *** | 0.26 | 0.00 | *** | |
| 2011 | 0.00 | 0.44 | 0.28 | 0.00 | *** | 0.31 | 0.00 | *** | |
| 2012 | 0.09 | 0.02 | * | 0.19 | 0.00 | *** | 0.35 | 0.00 | *** |
| 2013 | 0.00 | 0.44 | 0.10 | 0.01 | * | 0.27 | 0.00 | *** | |
<표 1>이 전역적(global)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 혹은 공간적 집적성(혹은 음의 값일 경우는 산개)를 보여준다면, 국지적(local)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을 높게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지역 수준에서 관찰되는 공간자기상관 구조를 산점도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상단은 분석의 초기 시점인 1998년을, 하단은 분석 기간의 말미인 2013년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각 시기는 다시 세 인구 집단의 자살률에 대한 분석 결과로 나뉘어 있다. 시군구 지역이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 산점도의 가로축은 지역 자살률을, 세로축은 공간자기상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의 편이를 위해 자살률의 평균을 세로 선으로 표시했으며, 지역의 자살률 증가에 따른 공간자기상관의 변화에 대한 추세선을 추가했다. 산점도에서 자살률 수준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공간자기상관 수준이 일반적인 추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 가운데서 국지적 수준의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도가 높은 지역을 자살 발생 수준이 높은 클러스터의 중심, 혹은 핫스팟(hot spot)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산점도상에서 로컬 수준에서 Moran’s I 값이 유의미한 지역을 따로 굵은 마름모꼴로 제시하였다.
1998년의 경우 세 연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간적 집적성이 관찰되었다.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추세도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우상향하는 정적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살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근 지역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공간적인 집적화가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적으로 자살률이 밀집되는 공간 클러스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20대 이하 집단에서 전역적 수준에서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을 사라졌다. 반면, 나머지 두 연령대에서는 집적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 집단의 경우 지역 자살률과 공간자기 상관 사이의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연령 집단에서 자살 발생이 공간적으로 더욱 밀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수의 자살 발생 밀집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결합궤적 유형의 공간적 분포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궤적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제시한 것이다. 유형화 분석의 반복적(iterative) 특성상 같은 유형수에 따른 분석도 케이스의 분류 결과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각 유형수(K)에 따라 200번의 반복 시행을 통해 분류된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집단과 가장 작은 집단의 평균 비율 및 Caliski-Harabatz 지수의 평균적 변화를 관찰했다. [그림 3]에서 점선은 집단 간 크기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를 왼쪽 세로축에 이를 표시하였다. Calinski-Harabatz 지수는 실선으로 제시하고 오른쪽 세로축에 표시했다.
Calinski-Harabatz 지수의 경우 유형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형수가 4일 때까지 비교적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형 간 크기 비율은 유형수가 2인 경우 1.5배, 3인 경우 2.1배, 4인 경우 1.7배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유형수가 5일 때 7.8배로 빠르게 변하면서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관찰 결과를 종합하면 유형수가 4인 경우가 유형 크기의 안정적인 균형 수준의 유지 가운데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네 가지 결합 궤적의 연령별 자살률 추이를 평균값의 변화를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유형A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궤적을 보이지만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했다. 유형C는 A와 가장 대비되는 궤적을 보였다. 유형C에 속하는 지역은 20대 이하 집단에서 자살률 수준이 유형 간 혼재되는 양상을 제외하고 연령대 전반에 걸쳐 자살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격하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자살률이 중간 수준을 보이는 B와 D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자살 위험의 서열성이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유형B는 30대~50대 자살률은 유형D에 비해 낮지만, 60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는 유형D에 비해 자살률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이행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적 유형화를 통해 드러난 지역 간 자살률의 종단적 패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 지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자살률이 상승하는 궤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유형A의 경우도 조사기간 내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자살률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 궤적을 보였다. 둘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 간 자살률의 서열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서열 구조는 분석 기간인 13년간 거의 고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셋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령 간 자살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자살 수준이 고연령 집단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이 지역 수준에서 계측한 자살률에서도 시계열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네 가지 결합 궤적의 특징을 전체 분석 기간에 걸친 연령별 자살률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는 연령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분산분석 결과와 본페로니 방법(Bonfferroni correction)을 활용한 사후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유형의 경우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다만,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D유형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유형은 [그림 3]에서 자살률의 상승 추세가 관찰되나, 연령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에서 “완만한 위험이행”궤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C유형은 세 연령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 자살률을 보였다. 다만 20대의 경우 D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은 연령별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통해 “전반적 고위험 이행”의 궤적 특성을 보였다. B유형과 D유형은 연령별 자살률의 서열이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B유형의 경우 D유형과 비교할 때 60대 이상 집단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노인 중심 위험 이행” 특성이 나타났다. D유형은 이와 달리 보다 연소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청장년 중심 위험 이행”의 궤적 특성을 보였다.
표 2
결합궤적 유형 간 연령별 자살률
| 궤적 유형 | ~20대 평균(SD) | 30대~50대 평균(SD) | 60대 이상 평균(SD) |
|---|---|---|---|
| A유형 (완만한 위험 이행) | 7.32(4.44) | 21.78(8.94) | 46.55(21.05) |
| B유형 (노인 중심 위험 이행) | 8.19(4.39) | 29.20(9.78) | 66.41(24.03) |
| C유형 (전반적 고위험 이행) | 10.76(8.84) | 44.37(15.95) | 73.88(36.87) |
| D유형 (청장년 중심 위험 이행) | 10.54(8.21) | 34.78(13.06) | 47.70(25.37) |
| F(3, 3996) = 66.6*** A<B<D=C |
F(3, 3996) = 625.8*** A<B<D<C |
F(3, 3996) = 247.5*** A=D<B<C |
특징적으로 대별되는 네 가지 궤적 유형이 지역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4]는 유형의 분포를 지도상에 제시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실측 비율을 사용한 지도에 궤적 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 그림은 지역별 면적 차이로 인해 결과 검토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재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
매핑 결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의 경우 유형A가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대다수 지역이 유형A에 속했으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등의 광역시를 거점으로 유형A에 속하는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B의 경우는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 지역이나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유형B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C와 유형D의 경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농어촌이라도 두 궤적 유형의 지리적 분포가 비교적 명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C유형의 경우 대부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 분포하는 패턴이 관찰된 반면, 유형D의 경우는 전라남북도의 다수 지역 및 경상남북도의 일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
<표 3>은 결합 궤적과 지역 간 관련성을 다룬 매핑 결과를 보다 확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결과변수인 결합 궤적의 경우 자살 위험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A유형(완만한 위험 이행)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명 변수인 지역 규모와 행정 구역은 각각 대도시와 수도권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표 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노인중심위험이행 (B유형, n=75) | 전반적고위험이행 (C유형, n=62) | 청장년중심위험이행 (D유형, n=57) | |
|---|---|---|---|
|
|
|||
| B(SE) | B(SE) | B(SE) | |
|
|
|||
| (intercept) | -0.83(0.32)* | -3.09(0.78)*** | -16.37(380.34) |
|
|
|||
| (Ref. = 대도시) | |||
| 일반 도시 | 0.85(0.38)* | 1.89(0.82)* | 1.24(0.57)* |
| 농어촌 지역 | 1.72(1.24) | 6.99(1.33)*** | 4.36(1.13)*** |
|
|
|||
| (Ref. = 수도권) | |||
| 충청강원권 | 2.27(0.80)*** | 2.46(0.94)* | 16.05(380.34) |
| 호남제주권 | -1.40(0.84) | -1.83(0.94) | 15.49(380.34) |
| 영남권 | 0.73(0.41) | -0.14(0.74) | 15.49(380.34) |
일반 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위험 궤적에서 노인 중심 위험 이행 궤적(B유형)을 따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것으로(b=0.85, p<.05)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충청강원권이 상대적으로 노인 중심 위험 궤적을 따른 가능성이 큰 것으로(b=2.27, p<.001)으로 나타났다.
완만한 위험 이행 궤적을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궤적을 보이는 C유형(전반적 고위험 이행)에 속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대도시에 비해 일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이 모두 전반적 고위험 이행 궤적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확률이 현저하게 높은(b=6.99, p<.001) 위험 양상을 보였다. 한편 행정구역을 검토했을 때, 수도권에 비해 충청강원권이 전반적 고위험 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b=2.46, p<.05) 드러났다.
청장년 중심 위험 이행(D유형)에 속할 확률을 검토한 결과 대도시에 비해 일반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해당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반적 고위험 이행 궤적의 경우와 동일하게 청장년 중심 위험 이행 궤적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b=4.36, p<.05)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지역 모두에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살 위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적으로 자기상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였다. 지역적 자기상관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살 발생이 밀집되는 지역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간적 밀집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의 지역적 고착 수준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일정 기간 공간적 집적이 관찰되었으나 이후에는 자살 위험이 공간적으로 산개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다. 우선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던 시점에 젊은 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가 자살 위험의 공간적 집적을 보였다는 것은, 경제적 충격에 특히 강한 충격을 받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여전히 자살 위험의 공간적 집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집적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힘의 존재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고연령 집단일수록 사회 전반, 혹은 지역 환경과 관련된 구조-빈곤, 노동시장, 산업구조, 사회적 격리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더욱 개별화된 위험 요인-인간관계, 정신 건강, 개인의 학업적 성취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지역적, 공간적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별 차이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층은 주로 성공적인 학업적 성취,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가족의 형성 등과 개인화된 일상의 문제에서 중요한 자아의 위기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Girard, 1993). 한편, 장년층 이상의 집단은 은퇴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자살 수행의 위험성을 높이는 심리적 상태인 ‘인지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Joiner, 2009) 또한 이들 집단은 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자아에 대한 위기 경험에 심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Girard, 1993). 물질적 향유 수준, 경제적 요건, 사회적 고립 수준 등은 모두 지역 특성과 높은 관련성을 맺는다는 점에서 장년층 이상의 집단에서 자살 위험과 지역의 관련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살 위험의 연령별 종단 구조는 지역적으로 분명한 유형으로 대별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자살 위험의 종단 궤적은 대도시, 일반시, 농어촌과 같은 지역 특성에 따른 구분은 물론, 행정 구역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분포 양상을 보였다. 종단궤적 간 자살 위험의 전반적인 서열 구조와 연령별 자살률의 패턴은 시간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했으며, 그 구조는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에 밀접하게 고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행된 (Chang et al., 2011; Phillips et al., 2002)의 연구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농촌 지역의 자살 위험이 특히 심각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같은 농촌이라고 해도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고착된 궤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한국 내 지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살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을 자살에 취약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사회 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힘은 한국 사회 내 지역 간 차등적인 구조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고착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따라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자살 위험이 공간적으로 분산된 양상이 주요함을 보았는데, 이는 젊은 층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의 자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줄이는 노력과 별개로 정신건강, 발달, 학업 성취, 진로 상담 등과 관련된 보다 개인화되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년 층 이상 집단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환경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장년층 이상의 자살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의료 인프라의 확충, 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경제적 불안정의 완화 등은 지역적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전략은 관련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공급자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관련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공급 결핍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정책 증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아울러 병행하는 공공 의료 및 상담 시설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 및 행정 조직과 같이 지역에 밀착하여 산개하고 있는 조직(street-level institutions) 관련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거나 정책 수요를 찾아가서 발굴하는 적극적 기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밀착 조직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 과정은 지역의 통합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Andrews & Jilke, 2016), 이는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도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이 주로 서비스 및 행정 인프라의 확충 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임을 고려할 때, 공급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은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상호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발한 정책 학습 및 이를 토대로한 공동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면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살 위험이 인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중요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자살 발생 수준은 구성원의 전반적 행복과 효용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Case & Deaton, 2017; Daly & Wilson, 2009).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살 위험이 지역 특성과 공간적 맥락 하에서 공고하게 고착화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뜻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전반의 통합 수준을 높이고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역적 불균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관찰 결과를 통해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착화된 지역간 불균등 구조를 약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향후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와 같이 자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자살로 정의할 경우 실제 자살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살이지만 의도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아 자연사나 사고사로 분류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살에 대한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Case & Deato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자료는 실제 자살을 축소해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가족주의적 습속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송재룡, 2008) 노인을 중심으로 자살을 과소 보고하게 할 우려가 있다. 즉,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돌아갈 부담이 염려되어 표면적으로 자살이 아닌 소극적 방식의 선택(식사를 하지 않는 등)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소 보고가 지역 간 격차를 다루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준의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추후 보다 정밀한 자살에 대한 정의 및 기초 자료의 확충을 통해 자살 예방 개입을 위한 보다 단단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시공간적 고착 구조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착 구조를 만드는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면상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고착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Notes
타당한 연령 구분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250여 개 시군구의 연령별 자살률의 상관구조를 사전에 검토했다. 그 결과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연령 간 자살률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관찰이 되었고, 60대 이상 연령대 간 자살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볼 때, 20대 이하를 학업 과정을 이수하거나 결혼과 같은 본격적인 삶의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로, 30대부터 50대까지를 본격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형성, 자녀 양육의 시기로, 60대 이후를 은퇴 이후 시기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 자살 위험의 상관관계가 묶여서 나타나는 것은 연령집단별로 생애사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삶의 위기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Girard(1993)는 연령대에 따라 달리 경험하는 생애사적 위기가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살 발생의 인구학적 구조가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20대 전후의 청년층과 60대 이후의 노년층 그리고 그 중간의 장년층이 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 사회의 독특한 자살 발생의 인구학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령 구분도 이런 이론적 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평균을 나타내는 세로 선과 공간자기상관의 수준에 대한 추세선에 의해 산점도가 네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로컬 Moran’s I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역 간 속성을 지도상에 표현할 때, 개별 지역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 연구 문제에 따라서 시각적 검토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도시화 수준이 높음에도 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경우 그와 같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서울 지역에 비해 거주 인구와 같은 속성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속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역 경계선에 대한 변형을 통해 시군구 면적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지도를 결과 제시에 함께 활용했다.
References
, , , , & (2001). Neighborhood disadvantage, stress, and drug use among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51-165. [PubMed]
, , , , , & (2011). Geography of suicide in Taiwan: Spatial patterning and socioeconomic correlates. Health and Place, 17, 641-650. [PubMed]
(200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rural suicid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cidence, and prevention.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7(4), 189-199. [PubMed]
, , , & (2015). Geography of suicide in Hong Kong: Spatial patterning, and socioeconomic correlates and inequalit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30, 190-203. [PubMed]
, & (2003). Stressful neighborhoods and depression: A prospective study of the impact of neighborhood disord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1), 34-44. [PubMed]
, , , , , & (2004). Suicide risk in small areas in England and Wales, 1991-1993.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1), 45-52. [PubMed]
, , , & (2005). The ecological association between suicide rates and indices of deprivation in English local authoriti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0(10), 785-791. [PubMed]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17-10-31
- 수정일Revised Date
- 2017-12-19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17-12-22

- 3511Download
- 2525Viewed